크리시포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크리시포스는 기원전 3세기 페니키아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로,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스토아 학파의 수장으로서, 제논과 클레안테스의 철학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논리학 분야에서 명제 논리를 발전시키고, 삼단논법과 같은 추론 규칙을 제시하여 고대 그리스 최고의 논리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우주의 유기적 통일성과 운명론을 주장하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자유 의지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그의 사상은 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19세기까지는 잊혀졌다가 20세기에 들어와 재조명되었다.
크리시포스는 페니키아 출신으로, 타르수스 출신 아폴로니우스의 아들로 킬리키아의 솔리에서 태어났다.[6][7][8] 그는 키가 작았고,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훈련받았다.[9][10] 젊은 시절 왕실 금고에 상당한 재산을 몰수당한 후,[11] 아테네로 이주하여 클레안테스의 제자가 되었다.[13]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아르케실라우스와 라키데스의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15]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철학의 주요 인물로, 플라톤 아카데미의 비판에 맞서 스토아 철학을 방어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제논과 클레안테스의 사상을 체계화하여 스토아 철학을 확립했으며, "만약 크리시포스가 없었다면, 스토아 철학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27]
2. 생애
스토아 학파 연구에 몰두하여 학문적 명성을 얻었으며, "원리를 주시면 제가 증명을 스스로 찾아내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적 자신감이 높았다.[10] 기원전 230년경 클레안테스가 사망하자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하루에 500행을 쓸 정도로 다작의 저술가였지만, 그의 저서는 대부분 소실되었고, 후대 작가들의 저작에 인용된 단편들만 남아있다. 헤르쿨라네움 파피루스에서 그의 저작 ''논리적 질문'', ''섭리에 관하여''의 일부와 세 번째 작품이 발견되었다.[24] 그는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논쟁의 양쪽 입장을 모두 취했으며,[15]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용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8] 난해하고 모호하며 문체가 부주의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능력은 높이 평가되어 학파의 권위자로 여겨졌다.[19]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크리시포스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20] 하나는 잔치에서 희석하지 않은 와인을 마시고 현기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나귀가 무화과를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당나귀에게 무화과를 씻어낼 순수한 와인을 주어라"라고 외친 후 웃다가 사망했다는 것이다.[21] 그는 제143회 올림픽 기간(기원전 208–204년)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2] 그의 조카 아리스토크레온은 케라메이코스에 그의 명예를 기리는 조각상을 세웠다.[22] 그의 뒤를 이어 타르수스의 제논이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 되었다.[23]
2. 1. 초기 생애와 배경
크리시포스는 페니키아 출신으로 추정되며,[6][7] 아버지는 타르수스 출신 아폴로니우스였다. 킬리키아의 솔리에서 태어났다.[8] 그는 키가 작았고,[9]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훈련받았다.[10]
젊은 시절, 크리시포스는 상당한 재산을 왕실 금고에 몰수당해 잃었다.[11] 이후 아테네로 이주하여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었던 클레안테스의 제자가 되었다.[13]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아르케실라우스와 그의 후계자인 라키데스의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15]
2. 2. 스토아 학파 입문과 학문적 성장
크리시포스는 페니키아 출신으로 추정되며,[6][7] 그의 아버지는 타르수스 출신 아폴로니우스였다. 그는 킬리키아의 솔리에서 태어났다.[8] 그는 키가 작았으며,[9] 장거리 달리기 선수로 훈련받았다고 한다.[10] 젊은 시절, 왕실 금고에 상당한 재산을 몰수당하고[11] 아테네로 이주하여, 당시 스토아 학파의 수장(''scholarch'')이었던 클레안테스의 제자가 되었다.[13] 그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아르케실라우스와 그의 후계자인 라키데스의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여겨진다.[15]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학파 연구에 열정적으로 몰두했으며,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의 학문적 명성은 상당했다.[10] 그는 지적인 대담함과 자신감으로 유명했는데, 클레안테스에게 "원리를 주시면 제가 증명을 스스로 찾아내겠습니다."라고 요청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다.[10] 그는 기원전 230년경 클레안테스가 사망하자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 되었다.
크리시포스는 토론을 매우 좋아하여 제자들로부터 이끌어낸 비판의 어느 쪽에든 서서 논쟁했다. 또한 하루에 500행을 쓰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하며 700편이 넘는 저서를 집필했지만[115], 현존하는 것은 키케로, 세네카, 갈레노스 등의 후세 저작에 인용된 극히 소수의 단편뿐이다.
크리시포스의 이념의 대부분은 제논, 아르케실라오스, 키오스의 아리스톤(:en:Aristo of Chios)의 가르침에서 형성되었다. 이후 클레안테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지만, 여러 면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2. 3. 스토아 학파의 수장
페니키아 출신으로 추정되는[6][7] 크리시포스는 킬리키아의 솔리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는 타르수스 출신 아폴로니우스였다.[8] 그는 젊은 시절 왕실에 재산을 몰수당하고[11] 아테네로 이주하여 클레안테스의 제자가 되었다.[13]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아르케실라우스와 라키데스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다.[15]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학파 연구에 매진하여 학문적 명성을 얻었다.[10] 그는 지적인 대담함과 자신감으로 유명했으며, "원리를 주시면 제가 증명을 스스로 찾아내겠습니다."라고 클레안테스에게 말한 일화가 전해진다.[10] 기원전 230년경 클레안테스가 사망하자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 되었다.
크리시포스는 다작의 저술가로, 하루에 500행을 쓰는 것을 목표로 705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다.[16][17] 그는 포괄적인 논의를 위해 논쟁의 양쪽 입장을 모두 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15] 이 때문에 그의 저서가 다른 사람의 인용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18] 그는 발언이 난해하고 모호하며 문체가 부주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능력은 높이 평가되어 학파의 권위자로 여겨졌다.[19]
2. 4. 죽음
크리시포스는 제143회 올림픽 기간(기원전 208–204년)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2]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그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20] 첫 번째 설명에서, 크리시포스는 잔치에서 희석하지 않은 와인을 마시고 현기증을 느껴 곧 사망했다. 두 번째 설명에서 그는 당나귀가 무화과를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당나귀에게 무화과를 씻어낼 순수한 와인을 주어라"라고 외쳤고,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사망했다.[21] 그의 조카 아리스토크레온은 케라메이코스에 그의 명예를 기리는 조각상을 세웠다.[22] 크리시포스의 뒤를 이어 스토아 학파의 수장이 된 사람은 그의 제자 타르수스의 제논이었다.[23]
3. 철학
크리시포스는 자연 철학과 지식 이론을 발전시켰고,[19] 명제 논리를 포함한 형식 논리의 많은 부분을 창조했다.[26] 그의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보다 명제 간의 관계에 주목했으며, 현대 논리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토아 학파에게 진리는 올바른 이성을 가진 현자에 의해 오류와 구별된다.[57] 크리시포스는 경험론적 인식론을 주장했는데,[58]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전의 경험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보았다.[58] 그는 감각의 인상을 "영혼에 새겨진 인상"으로 정의한 제논의 견해를 수정하여,[59] 영혼의 변화로 간주했다.[59]
크리시포스는 숙명론을 주장하며 모든 일은 운명에 따라 일어나고, 우연처럼 보이는 것에도 숨겨진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72] 그는 점(Divination)을 운명의 인과 사슬의 일부로 받아들여,[86] 징조와 전조가 특정 사건의 자연스러운 징후라고 믿었다.[87]
그는 우주가 곧 신이라고 믿었으며,[88]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목적론적 논증을 활용했다.[90] 또한 신들을 하나의 실재의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했다.[88]
크리시포스는 악의 문제에 대해, 악은 제거될 수 없으며 선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92] 그는 플라톤을 따라, 선이 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93]
크리시포스는 윤리학이 물리학에 의존한다고 보았으며,[103] 삶의 목표는 자연의 실제 흐름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따라, 자신의 인간 본성은 물론 우주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104] 그는 다루기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07]
3. 1. 스토아 철학의 체계화
크리시포스는 플라톤 아카데미[25]의 공격에 맞서 오랫동안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과거와 미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스토아 철학을 방어하고자 했다. 그는 제논과 클레안테스의 교리를 받아들여 스토아 철학의 결정적인 체계로 구체화했다.[25] 그는 스토아 철학의 자연 철학 교리와 지식 이론[19]을 발전시켰으며, 그들의 형식 논리의 많은 부분을 창조했다.[26] 요컨대 크리시포스는 스토아 철학 체계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만약 크리시포스가 없었다면, 스토아 철학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전해진다.[27]
크리시포스는 고대 그리스 최고의 논리학자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논리학자 중의 대가로 호메로스가 시인들의 대가였던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닌 크리시포스를 선택했다.[54]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만약 신들이 변증법을 사용한다면, 크리시포스의 변증법 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었다.[55] 크리시포스의 논리적 업적은 무시되고 잊혀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우세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더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부분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49] 19세기까지 스토아 철학의 논리학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이는 단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새로운 용어를 입힌,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인 체계로 여겨졌다.[56] 20세기, 논리학의 발전과 현대적인 명제 논리가 등장하면서 비로소 스토아 철학의 논리학이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음이 분명해졌다.[30]
크리시포스의 이념의 대부분은 제논, 아르케실라오스, 키오스의 아리스톤의 가르침에서 형성되었다. 이후 클레안테스의 가르침에 물들었지만, 여러 면에서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어 이를 변경하기로 했다.
3. 2. 논리학
크리시포스는 논리학에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명제 논리 체계를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술어 논리가 "소크라테스"나 "사람"과 같은 용어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반면, 스토아 논리학은 "날씨가 맑다"와 같은 명제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28][29] 메가라 학파 변증론자인 디오도루스 크로누스와 필로가 이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인 테오프라스토스와 에우데모스가 가언 삼단 논법을 연구했지만,[30] 이러한 원리들을 명제 논리의 일관된 체계로 발전시킨 것은 크리시포스였다.[30][31]
크리시포스는 언어, 이름, 용어의 처리를 분석하고,[19] 오류와 역설을 반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19]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에 따르면, 크리시포스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에 관한 12개의 저작을 23권의 책으로, 양의성에 관한 7개의 저작을 17권의 책으로, 그리고 다른 난제에 관한 9개의 저작을 26권의 책으로 저술했다.[51]
크리시포스는 4가지 스토아 범주 중 세 번째 범주, 즉 '어떤 식으로든 배치된' 범주가 증명된 최초의 스토아 학자이다.[52] 현존하는 증거에서 크리시포스는 '실체'와 '속성' 범주를 자주 사용하지만, 다른 두 가지 스토아 범주('어떤 식으로든 배치된' 및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것과 관련하여 배치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53]
스토아 학파에게 진리는 올바른 이성을 가진 현자에 의해 오류와 구별된다.[57] 크리시포스의 지식 이론은 경험론적이었다.[58] 감각은 외부 세계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며, 감각의 보고는 타고난 관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저장된 이전 보고와 비교함으로써 통제된다.[58] 제논은 감각의 인상을 "영혼에 새겨진 인상"이라고 정의했고, 이는 클레안테스에 의해 문자 그대로 해석되었는데, 그는 영혼에 새겨진 인상을 도장이 왁스에 새기는 인상에 비유했다.[60] 크리시포스는 그것을 영혼의 변화로 간주하는 것을 선호했다.[59]
인상을 받아들일 때, 영혼은 순전히 수동적이며, 인상은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원인 또한 드러낸다. 마치 빛이 자신과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59] 객체의 이름을 붙이는 힘은 이해에 있다. 먼저 인상이 오고, 이해는 발화의 힘을 가지고 객체로부터 받은 영향을 말로 표현한다.[61] 참된 표상은 기억, 분류 및 비교를 사용하여 거짓된 표상과 구별된다.[58] 감각 기관과 마음이 건강하고 외부 객체를 실제로 보고 들을 수 있다면, 명료함과 명확성으로 인해 표상은 항상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동의를 얻어내거나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62] 사람들이 합리적인 존재로 이해되는 맥락에서, 이 개념들로부터 이성이 발달한다.[63]
3. 2. 1. 조건 명제
스토아 논리학에서 조건 명제와 관련된 논쟁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디오도루스 크로누스와 그의 제자 필로가 있었다. 500년 후,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이들 사이의 논쟁을 기록했다.[36] 필로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건 명제를 참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만약 낮이라면,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명제는 낮이고 내가 침묵하지 않는 한 참이다.[37] 그러나 디오도루스는 참인 조건 명제는 전건이 거짓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낮이라면,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명제는 낮에 내가 침묵할 수 있으므로 거짓일 수 있다.[36] 디오도루스는 "만약 사물의 원자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자 요소가 존재한다"와 같은 역설적인 명제도 참으로 인정했다.[37]
크리시포스는 조건 명제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러한 역설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38] 그는 후건의 부정이 전건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조건 명제가 참이라고 보았다.[39] 이는 현대의 엄격한 조건 명제와 유사하다.[39]
3. 2. 2. 삼단논법
크리시포스는 논리학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명제 논리 체계를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술어 논리가 "소크라테스"나 "사람"과 같은 용어들 사이의 관계("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에 주목한 반면, 스토아 논리학은 "날씨가 맑다"와 같은 명제들 사이의 관계("날씨가 맑으면 밝다: 그러나 날씨가 맑다: 따라서 밝다")에 주목했다.[28][29]
디오도루스 크로누스와 그의 제자 필로는 조건 명제에 대해 논쟁한 최초의 논리학자들이었다. 필로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조건 명제를 참으로 간주했다. 반면 디오도루스는 참인 조건 명제는 전건이 거짓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했다.[36] 크리시포스는 조건 명제에 대해 더 엄격한 견해를 채택하여, 후건의 부정이 전건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참이라고 보았다.[39]
크리시포스는 삼단논법 또는 연역 체계를 개발했는데, 5가지 기본 논증 형식('indemonstrable syllogisms')을 공리로 사용했다.[40] 또한 복잡한 삼단논법을 이러한 공리로 축소할 수 있는 4가지 추론 규칙('themata')을 사용했다.[41][42] 5가지 기본 논증 형식은 다음과 같다:[43][44]
| 이름 | 설명 | 예시 |
|---|---|---|
| 전건 긍정 | 만약 A이면 B이다. A이다. 그러므로 B이다. | 만약 낮이면, 밝다. 낮이다. 그러므로 밝다. |
| 후건 부정 | 만약 A이면 B이다. B가 아니다. 그러므로 A가 아니다. | 만약 낮이면, 밝다. 밝지 않다. 그러므로 낮이 아니다. |
| 절대 긍정/부정식 (i) | A와 B가 모두 아니다. A이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 낮과 밤이 모두 아니다. 낮이다. 그러므로 밤이 아니다. |
| 절대 긍정/부정식 (ii) | A이거나 B이다. A이다. 그러므로 B가 아니다. | 낮이거나 밤이다. 낮이다. 그러므로 밤이 아니다. |
| 선언지 긍정/부정식 | A이거나 B이다. A가 아니다. 그러므로 B이다. | 낮이거나 밤이다. 낮이 아니다. 그러므로 밤이다. |
4가지 추론 규칙 중[46] 2가지, 즉 반논법 규칙인 첫 번째 'thema'와 연쇄 삼단논법을 단순 삼단논법으로 축소할 수 있는 절단 규칙인 세 번째 'thema'만 살아남았다.[47][48] 스토아 삼단논법의 목적은 형식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속한 우주를 지배하는 신성한 이성('logos')의 작용을 연구하는 것이었다.[49]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에 따르면, 크리시포스는 개가 냄새를 맡아 어떤 길로 갈지 선택할 때 선언 삼단논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론을 인간의 정의적 측면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과는 대조적이다.[50]
3. 3. 인식론
크리시포스는 언어, 이름, 용어의 처리를 분석했으며,[19] 오류와 역설을 반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19]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에 따르면, 크리시포스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에 관한 책 23권(12개 저작), 양의성에 관한 책 17권(7개 저작), 기타 난제에 관한 책 26권(9개 저작)을 저술했다.[51] 퍼즐이나 역설에 관해 총 66권의 책(28개 저작)을 썼다.[51]크리시포스는 4가지 스토아 범주 중 세 번째 범주인 '어떤 식으로든 배치된' 범주를 증명한 최초의 스토아 학자이다.[52] 현존하는 증거에서 크리시포스는 '실체'와 '속성' 범주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두 가지 스토아 범주('어떤 식으로든 배치된',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것과 관련하여 배치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53] 범주가 크리시포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며, 명확한 범주 교리는 후기 스토아 학자들의 업적일 수 있다.[53]
3. 4. 자연학 (물리학)
크리시포스는 우주가 곧 신이라고 믿었으며, "우주 자체가 신이며, 그 영혼의 보편적인 발산"이라고 주장했다.[88] 그는 우주의 지침 원리가 "사물들의 공통된 본성과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총체와 함께 정신과 이성 안에서 작용한다"고 보았다.[88]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막스 베른하르트 바인슈타인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크리시포스를 범신론자로 규정했다.[89]크리시포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목적론적 논증을 활용했다. 그는 인류가 만들어낼 수 없는 천체 등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인류보다 우월하며, 신 외에 인류보다 우월한 존재는 없으므로 신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90]
크리시포스는 신과 신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하나의 실재의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크리시포스는 제우스는 아이테르, 포세이돈은 바다를 관통하는 공기, 데메테르는 땅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신들의 이름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었다.[88] 또한 그는 아름다운 집이 쥐가 아닌 주인을 위해 지어진 것처럼, 우주도 신들의 거처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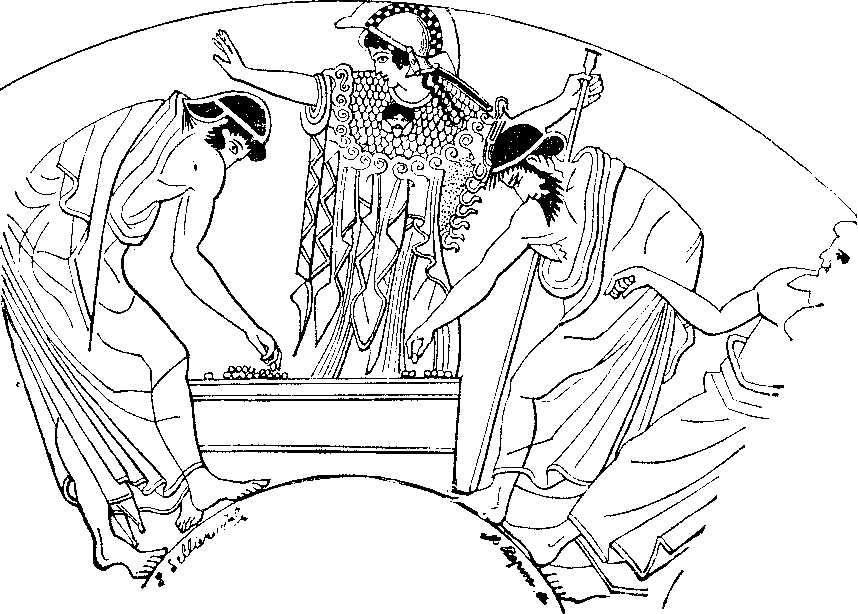
크리시포스는 점(Divination)을 운명의 인과 사슬의 일부로 받아들였다.[86] 그는 징조와 전조가 특정 사건의 자연스러운 징후이며, 섭리의 과정에는 수많은 징후가 있지만 대부분 관찰되지 않고 소수만이 인간에게 알려진다고 보았다.[87] 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점과 점이 제공하는 경고에 따른 행동 모두 인과의 사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87]
스토아 철학의 원리는 세계가 질서(κόσμος|코스모스el)라는 것이다. 크리시포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로고스 (세계의 도리)는 자연과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 프뉴마는 질서 속에서 개별적인 성장·창조 운동을 이끄는 지속 요소이다.
- 이 "운동"은 토노스(긴장)의 입/절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크리시포스는 선한 우주에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악은 제거될 수 없으며, 제거되는 것이 좋지도 않다"라고 답했다.[92] 그는 플라톤을 따라 선이 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는 불의 없이는, 용기는 비겁함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93] 또한 겉으로 보이는 악은 자연의 선함의 결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두개골은 유용성을 위해 작고 얇은 뼈로 만들어져야 했지만, 이 때문에 타격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93] 그는 악이 제우스의 합리적인 의지에 따라 분배되며, 이는 악인을 벌하거나 전체 세계 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94] 크리시포스는 악을 고대 그리스 희극의 거친 농담에 비유하며, 개별적으로 보면 불쾌하지만 전체적으로 작품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악도 유용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95]
3. 4. 1. 운명론
크리시포스는 모든 일은 숙명에 따라 일어나며, 우연처럼 보이는 것에도 숨겨진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72] 그는 세계의 통일성은 원인에 따른 사슬과 같은 의존성에 있으며, 충분한 원인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73][74] 크리시포스에 따르면 모든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며, 이는 미래의 사건에도 적용된다.[75]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만약 어떤 움직임이 원인 없이 존재한다면, 모든 명제가 참이나 거짓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원인이 없는 것은 참도 거짓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러므로 원인 없는 움직임은 없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결과는 이전의 원인에 기인한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모든 일은 숙명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숙명에 의해 일어난다는 결론이 나온다.한국어 [76]
스토아학파의 숙명론은 전적으로 전체로서의 우주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별 사물과 사람은 이 전체의 의존적인 부분으로만 고려된다.[77] 모든 것은 이 관계에 의해 결정되며, 세계의 일반적인 질서에 종속된다.[73]
모든 것이 숙명에 의해 결정된다면 개인적인 책임은 없다는 반박에 대해, 크리시포스는 단순한 예정과 복잡한 예정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고 대답했다.[78] 예를 들어, 병에 걸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명일 수 있지만, 회복이 의사와의 상담과 관련된다면, 의사와의 상담은 회복과 함께 일어나는 운명이며, 이것은 복잡한 사실이 된다.[79] 즉, 모든 인간의 행동은 사물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80] 크리시포스는 사건이 "공동 숙명"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79]
그는, 외투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과 공동 숙명이며, 누군가가 적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그 적들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공동 숙명이며, 아이를 갖는 것은 여자와 기꺼이 잠자리를 같이하는 것과 공동 숙명이라고 말한다. ... 많은 일들이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가장 맹렬한 열정과 열성을 기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데, 그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일어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명에 포함된다고 그는 말한다.한국어 [81]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미리 결정되어 운명의 광대한 네트워크와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우리 자신의 것이다.[82]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힘은 어디에서나 활동하며, 각 개별 존재의 본성에 따라 작용한다.[83] 모든 행동은 사물의 본성과 행위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원인들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다.[83] 우리의 행동은 외부 원인만으로, 의지가 외부 원인과 협력하지 않고 생성될 때만 자발적이지 않게 된다.[83] 덕과 악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우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84] 도덕적 책임은 의지의 자유에만 달려 있으며,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것이다.[84] 이러한 결정론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키려는 입장은 온건한 결정론 또는 양립 가능론으로 알려져 있다.[85]
크리시포스는 선한 우주에서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악은 제거될 수 없으며, 제거되는 것이 좋지도 않다"라고 답했다.[92] 그는 플라톤을 따라, 선이 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는 불의 없이는, 용기는 비겁함 없이는, 절제는 무절제 없이는, 지혜는 어리석음 없이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93] 또한, 겉으로 보이는 악은 자연의 선함의 결과로 존재하며, 인간의 두개골이 유용성을 위해 작고 얇은 뼈로 만들어졌지만, 이로 인해 타격에 취약해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93] 악은 제우스의 합리적인 의지에 따라 분배되는데, 이는 악인을 벌하거나 전체 세계 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94] 크리시포스는 악을 고대 그리스 희극의 거친 농담에 비유하며, 개별적으로 보면 불쾌하지만 전체적으로 작품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악도 유용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95]
많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대의 운명론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크리시포스는 만사가 운명에 의해 일어난다는 입장을 취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운명의 것은 모두 현실적인 질서 속에서 일어난다. 크리시포스는 더 나아가 악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악은 그것에 대응하는 선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악은 선의 결과이다. "불공정이 없으면 공정도 있을 수 없다. 겁이 없으면 용기도 없다. 거짓이 없으면 진실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3. 4. 2. 점술
크리시포스는 운명의 인과 사슬의 일부로 점(Divination)을 받아들였다.[86] 미래가 우연의 산물이라면 점술가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74] 그는 징조와 전조가 특정 사건의 자연스러운 징후라고 믿었다.[87] 섭리의 과정에는 수많은 징후가 있어야 하며, 대부분은 관찰되지 않고, 그 의미가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87] 모든 사건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시포스는 점과 점이 제공하는 경고에 따른 우리의 행동 모두 인과의 사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87]3. 4. 3. 신과 우주
크리시포스는 우주가 곧 신이라고 믿었으며, "우주 자체가 신이며, 그 영혼의 보편적인 발산"이라고 주장했다.[88] 그는 우주의 지침 원리가 "사물들의 공통된 본성과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총체와 함께 정신과 이성 안에서 작용한다"고 보았다.[88]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막스 베른하르트 바인슈타인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크리시포스를 범신론자로 규정했다.[89]크리시포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목적론적 논증을 활용했다. 그는 만약 인류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인류보다 더 훌륭하며, 우주에 있는 천체 등은 인류가 만들 수 없으므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 즉 신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90]
크리시포스는 신과 신들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전통적인 그리스 종교의 신들을 하나의 실재의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크리시포스는 아이테르가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다를 관통하는 공기가 포세이돈이며, 땅은 데메테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신들의 이름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었다.[88] 또한 우주는 보편적인 신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91]
선한 우주에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크리시포스는 "악은 제거될 수 없으며, 제거되는 것이 좋지도 않다"라고 답했다.[92] 그는 플라톤을 따라 선은 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정의는 불의 없이는, 용기는 비겁함 없이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93] 또한 겉으로 보이는 악은 자연의 선함의 결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두개골은 유용성을 위해 작고 얇은 뼈로 만들어져야 했지만, 이 때문에 두개골이 타격에 취약해졌다는 것이다.[93] 그는 악이 제우스의 합리적인 의지에 따라 분배되며, 이는 악인을 벌하거나 전체 세계 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94] 크리시포스는 악을 고대 그리스 희극의 거친 농담에 비유하며, 개별적으로 보면 악을 비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이 유용하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5]
스토아 철학의 원리는 세계가 질서(κόσμος|코스모스el)라는 것이다. 크리시포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 로고스 (세계의 도리)는 자연과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
- 프뉴마는 질서 속에서 개별적인 성장·창조 운동을 이끄는 지속 요소이다.
- 이 "운동"은 토노스(긴장)의 입/절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크리시포스가 논리, 특히 명제 논리의 문제에 관한 저작에 큰 부분을 할애한 것이라고 한다.
3. 5. 윤리학
크리시포스는 언어, 이름, 용어의 처리를 분석하고, 오류와 역설을 반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19]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에 따르면, 크리시포스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에 관한 저작 23권, 양의성에 관한 저작 17권, 기타 난제에 관한 저작 26권을 남겼다.[51]크리시포스는 4가지 스토아 범주 중 '어떤 식으로든 배치된' 범주를 증명한 최초의 스토아 학자이다.[52] 그는 '실체'와 '속성' 범주는 자주 사용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배치된' 및 '어떤 식으로든 다른 것과 관련하여 배치된' 범주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53] 범주가 크리시포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며, 명확한 범주 교리는 후기 스토아 학자들의 업적일 수 있다.[53]
3. 5. 1. 덕과 정념
크리시포스는 윤리학이 물리학에 의존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모든 것의 본성과 우주의 관리를 통해 선과 악, 덕 또는 행복의 주제에 접근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103] 크리시포스는 삶의 목표는 자연의 실제 흐름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104] 개인의 본성은 전체 우주의 일부이므로,[105] 삶은 자신의 인간 본성은 물론 우주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106] 인간의 본성은 윤리적이며, 인류는 이성으로 구현된, 물질적이면서도 원초적인 불 또는 아이테르에서 발산하는 신과 유사하며, 사람들은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107]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며, 이 자유는 비이성적인 욕망(욕정, 부, 지위, 지배 등)으로부터의 해방과 의지를 이성에 종속시키는 데 있다.[107] 크리시포스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의지의 힘을 가장 강조했다.[107]스토아 학파는 선과 악 사이에 세 번째 부류의 것, 즉 무관심한 것('아디아포라')을 인정했다.[108] 도덕적으로 무관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건강, 부, 명예를 포함하고 가장 나쁜 것은 질병과 가난을 포함한다.[109] 크리시포스는 일반적인 용법에서 선호하는 무관심한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임을 인정했지만,[108] 현명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말했다.[109] 덕을 개인에게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습과 습관이 필요하다. 즉, 도덕적 진보라는 것이 존재하며 성격이 형성되어야 한다.[107]

스토아 학파는 다루기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이는 그들이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정념 또는 감정(''pathe'')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이다.[107] 크리시포스는 감정 치료에 관해 ''정념에 관하여'' (Περὶ παθῶν|페리 파톤el)라는 책을 썼다.[110] 정념은 영혼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질병과 같으므로, 그는 정념을 근절하려 했다(''무정념'').[110] 잘못된 판단은 스스로의 탄력을 얻을 때 정념으로 변하는데, 이는 달리기를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것과 같다.[111] 사랑이나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정념을 근절할 수 없으며, 오직 침착할 때만 가능하다.[112] 그러므로 미리 준비하여 정념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다루어야 한다.[113] 탐욕, 자만, 욕정 같은 정념에 이성을 적용함으로써, 그것이 초래하는 해악을 이해할 수 있다.[113]
크리시포스는 덕이 영혼의 본질이며, 덕, 영혼, 육체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 조화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게다가 고귀함은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개인의 지위나 유산을 부정했다. 우리는 같은 신적 기원의 산물이며, 고귀함은 덕의 실증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시포스는 개개인이 사회 질서의 공정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봉사와 친절의 단계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시포스에게 특정 개인에게 향하는 것은 영웅 숭배나 찬미가 아니라, 휴머니타스(humanitas, 동정심, 추론, 지능)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임을 정의하는 특징, 즉 절제, 지식, 용기, 정직을 흠 없이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스토아 학파는 설파했다.
참조
[1]
사전
Chrysippus
http://www.dictionar[...]
Random House Webster's Unabridged Dictionary
[2]
간행물
1999
[3]
간행물
1999
[4]
간행물
2000
[5]
간행물
1969
[6]
서적
Encyclopedia of Classical Philosophy
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2013
[7]
웹사이트
Chrysippus of Soli
https://mathshistory[...]
School of Mathematics and Statistics, University of St Andrews, Scotland
1999-04
[8]
간행물
1970
[9]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2
[10]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79
[11]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1
[12]
간행물
1993
[13]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79
[14]
간행물
1999
[15]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4
[16]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1
[17]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0
[18]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1, x. 26–27
[19]
간행물
1908
[20]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5
[21]
서적
The Stoics Reader: Selected Writings and Testimonia
https://books.google[...]
Hackett Publishing
2008-09-11
[22]
문서
Plutarch, De Stoicorum Repugnantiis; Diogenes Laërtius, vii. 183
[23]
문서
Eusebius, Praeparatio Evangelica, 15. 18; Diogenes Laërtius, vii. 35
[24]
간행물
2004
[25]
문서
Chrysippus, J. O. Urmson, Jonathan Rée, The Concise Encyclopedia of Western Philosophy
[26]
간행물
1999
[27]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183
[28]
간행물
2014
[29]
간행물
An Introduction to Stoic Logic
1978
[30]
간행물
1998
[31]
간행물
2014
[32]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65
[33]
간행물
1970
[34]
간행물
1970
[35]
간행물
1998
[36]
서적
Pyr. Hyp.
[37]
서적
Pyr. Hyp.
[38]
서적
[39]
서적
[40]
서적
[41]
서적
[42]
논문
Stoic Syllogistic
[43]
서적
[44]
서적
[45]
서적
[46]
서적
[47]
서적
[48]
웹사이트
Ancient Logic: Stoic Syllogistic
logic-ancient/#StoSy[...]
[49]
서적
[50]
서적
Outlines of Pyrrhonism
[51]
서적
[52]
논문
"The Stoic Theory of Categories"
[53]
서적
[54]
서적
Stromata
[55]
서적
[56]
서적
[57]
서적
[58]
서적
[59]
서적
[60]
서적
[61]
서적
[62]
서적
[63]
서적
[64]
서적
De Natura Deorum
[65]
웹사이트
De Stoicorum Repugnantiis
https://www.perseus.[...]
[66]
서적
[67]
서적
[68]
서적
[69]
서적
[70]
서적
Stoicism
Routledge
[71]
웹사이트
Chrysippus |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iep.utm.edu/[...]
[72]
서적
[73]
서적
[74]
서적
[75]
서적
[76]
문서
On Fate
[77]
서적
[78]
서적
[79]
서적
On Fate
[80]
서적
[81]
간행물
Praeparatio evangelica
Eusebius of Caesarea
[82]
서적
[83]
서적
[84]
서적
[85]
서적
[86]
서적
[87]
서적
[88]
문서
De Natura Deorum
[89]
문서
Welt- und Lebensanschauungen, Hervorgegangen aus Religion, Philosophie und Naturerkenntnis
[90]
문서
De Natura Deorum
[91]
문서
De Natura Deorum
[92]
문서
De Stoicorum Repugnantiis
[93]
문서
[94]
문서
De Stoicorum Repugnantiis
[95]
문서
De Communibus Notitiis
[96]
서적
[97]
서적
[98]
문서
De Communibus Notitiis
[99]
서적
[100]
서적
[101]
문서
in Nicom.
[102]
문서
On The Doctrines of Hippocrates and Plato
[103]
서적
[104]
서적
[105]
문서
[106]
문서
Diogenes Laërtius, vii. 88
[107]
서적
[108]
서적
[109]
서적
[110]
서적
[111]
서적
[112]
서적
[113]
서적
[114]
서적
ギリシア哲学者列伝 VII.181
[115]
서적
ギリシア哲学者列伝 VII.181
[116]
서적
ギリシア哲学者列伝 VII.185
[117]
서적
What a Way to Go, Deaths with a Difference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