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카리알라 군정청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동카리알라 군정청은 1941년 7월부터 1944년까지 핀란드가 점령한 동카리알라 지역의 행정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핀란드의 팽창주의적 목표와 대 핀란드주의 이념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육군의 통제를 받았다. 군정청은 아우누스, 마아셀캐, 비에나의 세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각 구역은 핀란드어와 러시아어 지명이 함께 사용되었다. 벨리 메리코스키 법학 교수는 군정청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학술 카렐리아 협회는 군정청의 행정 및 문화 발전을 지원했다. 군정청은 핀란드화 정책, 인구 조사 및 재정착, 강제 수용소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핀란드가 러시아령 카리알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2] 동카리알라는 카렐리즘에서 핀란드 문화의 발상지이자 칼레발라 서사시의 배경이 되는 고대 영토로 여겨졌다.[2] 핀란드 내 반러시아 감정이 커지면서 "카렐리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다.[2] 핀란드 내전 중과 그 이후, 카렐리야 동족을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자발적인 원정대가 파견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2]
핀란드의 러시아 카리알라에 대한 관심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2] 동카리알라는 핀란드 문화의 요람이자 칼레발라의 영웅 서사시가 탄생한 고대 땅으로 여겨졌다.[2] 핀란드 내에서 반러시아 감정이 커지면서 "카렐리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다.[2] 핀란드 내전 중과 이후, 카렐리야의 "동족"을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자발적인 원정대가 조직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2]
2. 배경
계속 전쟁이 발발하고 독일이 소련을 빠르게 점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 핀란드 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2] 핀란드는 민족 문화적 유대와 군사 안보적 필요성을 내세워 동카리알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2] 1941년 봄, 핀란드 정치 지도부는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알려진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의 전모를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리스토 류티 대통령은 지리학 교수 베이뇌 아우에르와 역사학자 에이노 유티칼라에게 동카리알라가 핀란드의 자연스러운 생활권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라고 지시했다.[3] 그 결과물인 ''핀란드의 생활권''(Finnlands Lebensraumde)이라는 책이 1941년 가을 출판되었는데, 이는 핀란드의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정당화하려는 목적이었다.[3] 역사학자 얄마리 야코올라가 쓴 비슷한 내용의 책 ''핀란드의 동방 문제''(Die Ostfrage Finnlandsde)도 같은 해 여름에 출판되었다.[4]
이러한 핀란드의 팽창주의적 목표는 핀란드 국방군 총사령관 C. G. E. 만네르헤임 원수가 1941년 7월 10일 발표한 검집 선언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이 선언은 핀란드 내전 당시 그가 발표했던 선언에 기반한 것이었다.[5]
3. 조직
동카리알라 군정청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정부가 아닌 핀란드 육군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2][6] 군정청은 초기에 3개의 구역("피이리", piirifi)으로 나뉘었고, 각 구역은 다시 여러 하위 지역("알루에", aluefi)으로 세분화되었다. 군정청은 공식적으로 핀란드-카리알라어 지명만을 사용했으며, 러시아어 지명은 괄호 안에 병기되었다.
다음은 동카리알라 군정청의 초기 행정 구역 목록이다.[7]구역 (piirifi) 하위 지역 (aluefi) 아우누스 (올로네츠) 구역 앤이스린나/오네가보르그 (페트로자보츠크) 시 아우누스 비텔레 비엘야르비 콘토포하 (콘도포가) 문야르비 (무노제로) 테루/프래애새 (프랴자) 수우트야르비 (숄토제로) 바아세니 (바지니) 앤이니에미 (자오네제) 앤이센란타 (프리오네슈스키) 마아셀캐 (마셀가) 구역 루카야르비 (루고제로) 파아테네 (파다니) 포라야르비 (포로소제로) 카르후매키 (메드베제고르스크) 레폴라 비에나 (벨로모리에) 구역 키에스틴키 (케스텐가) 우흐투아 (욱타)
1942년 말, 마아셀캐 구역은 폐지되었다. 폐지된 마아셀캐 구역의 하위 지역 중 카르후매키, 파아테네, 포라야르비는 아우누스 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레폴라와 루카야르비는 비에나 구역으로 이관되었다.
3. 1. 본부
군정청 본부는 초기에 핀란드 육군 참모 본부가 위치한 미켈리에 있었다. 이후 1943년 10월 15일 요엔수로 이전했으며, 같은 해 11월 15일 최종적으로 Äänislinna(페트로자보츠크)로 본부를 옮겼다.[8]
3. 2. 군사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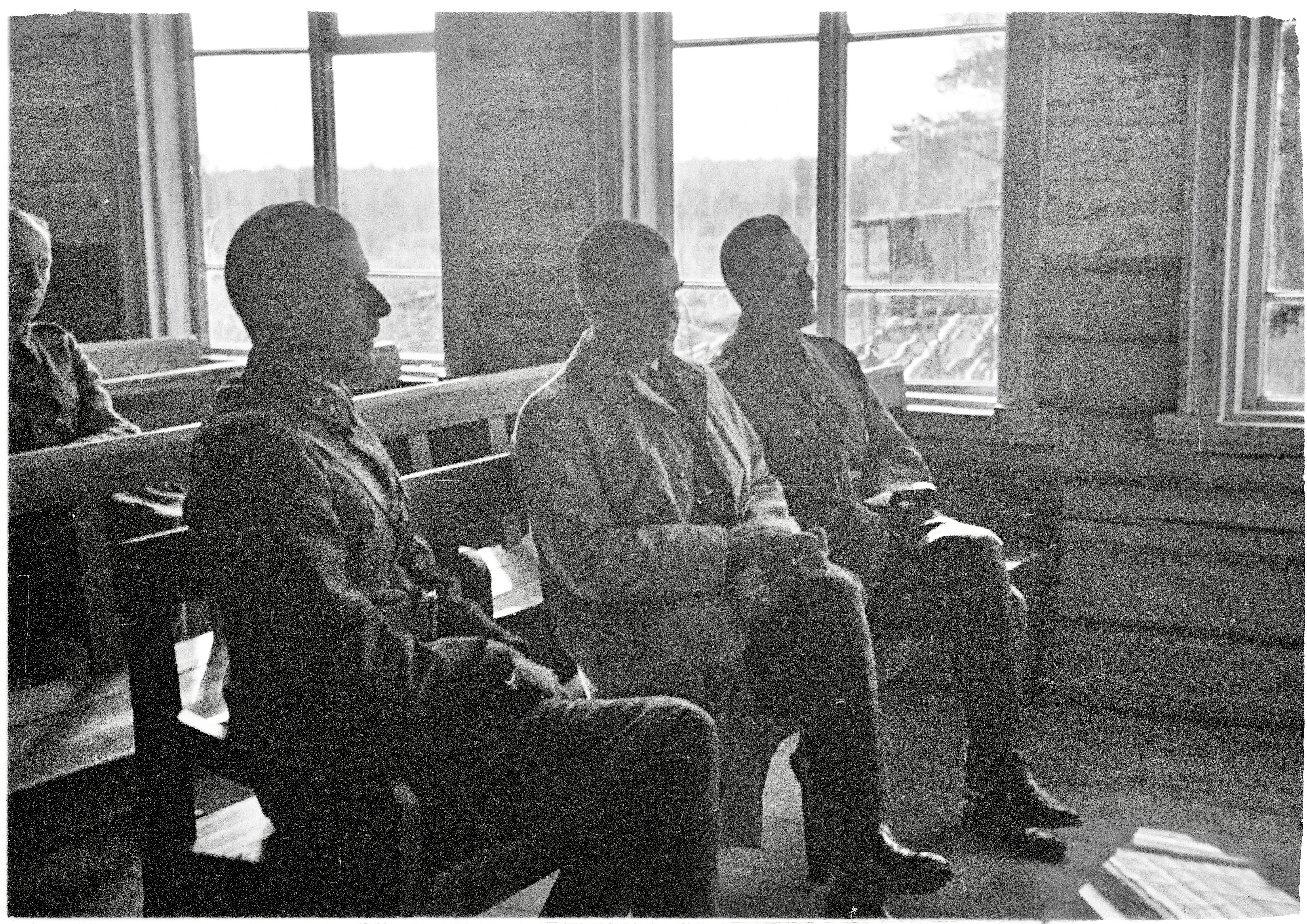
군정청 초대 사령관은 광산 고문이자 엔소-구트차이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중령 베이뇌 코틸라이넨이었다. 코틸라이넨의 뒤를 이어 1942년 6월 15일부터 1943년 8월 19일까지 대령 J. V. 아라유우리가, 마지막으로 종전 때까지 올리 팔로헤이모 대령이 그 직을 맡았다.[9]
군사령관 참모에는 행정법 교수 벨리 메리코스키가 근무했는데, 그의 임무는 군정청이 국제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10] 계속 전쟁이 끝난 후 메리코스키는 군정청에 대한 소책자를 저술했는데, 그 내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묘사했다.[10] 이는 다가올 평화 협상에서 핀란드의 입장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10]
3. 3. 학술 카렐리아 협회
학술 카렐리아 협회(AKS) 회원들은 핀우그리아 활동가 단체로서 군정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11] 계속 전쟁 동안 동카렐리아의 점령은[11] AKS 활동의 주요 목표가 되었으며, AKS 회원들은 이 단체의 대 핀란드 이념에 따라 군정청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11] 1941년 여름에는 군정청 초기 고위 지도부의 절반 이상이 AKS 회원으로 채워졌다.[11]
4. 정책
계속 전쟁 발발과 소련에 대한 독일의 빠른 승리에 대한 기대는 핀란드의 영토 확장주의를 다시 부추겼다.[2] 핀란드는 민족 문화적 요인과 군사 안보적 필요성을 내세워 동카리알라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려 했다.[2] 1941년 봄, 핀란드 정치 지도부가 독일의 소련 침공 계획의 전모를 파악하자, 류티 대통령은 지리학 교수 베이뇌 아우에르와 역사학자 에이노 유티칼라에게 동카리알라가 핀란드의 자연스러운 생활권임을 "학술적으로" 증명하도록 의뢰했다.[3] 그 결과물인 책 ''핀란드의 생활권''(Finnlands Lebensraumdeu)은 1941년 가을에 출판되어, 핀란드의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쓰였다.[3] 역사학자 얄마리 야코올라 역시 비슷한 내용의 책 ''핀란드의 동방 문제''(Die Ostfrage Finnlandsdeu)를 같은 해 여름에 출판했다.[4]
핀란드의 팽창주의적 목표는 만네르헤임 핀란드 국방군 총사령관이 1941년 7월 10일 발표한 검집 선언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는 핀란드 내전 당시 그가 발표했던 선언에 기반한 것이었다.[5] 군정청의 장기적인 목표는 소련에 대한 독일의 최종 승리 이후 동카리알라를 핀란드 국가에 영구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1] 이를 위해 핀란드 점령군은 현지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려 시도했다.[10]
4. 1. 페니제이션
대부분의 동카리알라 지명은 카리알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KFSSR)에서 사용되던 역사적인 핀란드어나 카리엘어 명칭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변경은 필요하지 않았다.[12] 하지만 "Petroskoi"(페트로자보츠크)는 이름이 너무 러시아식이라는 이유로 개명 대상이 되었다. 이 도시는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의 테아트룸 오르비스 테라룸에 나온 "Onegaborg"를 핀란드어로 직역한 "Äänislinna"로 이름이 바뀌었다.[3][13]
핀란드 군대가 백해 연안의 켐(Kemi)까지 진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도시 역시 개명될 예정이었다. 핀란드 라플란드에 이미 같은 이름의 도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14] 새로운 이름으로는 "Vienanlinna"(비에나의 성)가 잠정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는 Hämeenlinna, Savonlinna 등 "-linna"(성) 접미사를 사용하는 다른 핀란드 도시들의 이름과 유사성을 고려한 것이었다.[14]
거리 이름은 만네르헤임, 엘리아스 뢴로트, 엘리아스 시모요키, 파아보 탈벨라와 같은 핀란드의 주요 인물이나 애국자들의 이름, 또는 핀란드 민족 서사시인 칼레발라와 칸텔레타르에 등장하는 이름으로 변경될 계획이었다.[15] 또한 카리엘인 주민들에게는 자녀에게 슬라브 이름을 짓지 않도록 권고되었다.[15]
4. 2. 민족 정책
1941년 당시 동카리알라에 남아있던 인구는 약 85,000명 미만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전쟁 전 인구 약 300,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였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주로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다.[16] 핀란드 군정 당국은 이들 중 약 절반 정도를 "민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족"에는 카렐리안, 핀란드인, 에스토니아인, 잉그리아인, 베프스인 등 핀란드와 혈연적으로 가깝다고 여겨지는 heimo|헤이모fin(동족) 및 기타 소수 핀족이 포함되었다.[16][17] 나머지 대다수 인구는 "비민족"으로 분류되었으며, 주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이었다.[17]
그러나 핀란드 당국은 주민들을 "민족"과 "비민족"으로 나누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언어적, 민족적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7] 결국 분류는 민족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는 때때로 다소 사이비 과학적인 인류학 이론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러시아어만 사용하는 카렐리안이나 다국적 가정의 자녀들도 일반적으로 "민족"으로 분류되었다.[16][17] 핀란드 군정의 장기적인 목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비민족"으로 분류된 인구를 독일 점령 러시아 지역으로 추방하는 것이었다.[16]
4. 3. 교육 및 선전
핀란드 측은 카렐리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핀란드주의에 초점을 맞춘 선전을 펼쳐 점령군을 해방자로 묘사하고, 카렐리야인과 러시아인 간의 적대감을 조장하려 했다.[18] 군정청의 주요 선전 도구는 신문 ''바파 카르잘라''("자유 카렐리야")와 아우누스 라디오였다.[19]
7세에서 15세 사이의 "민족"으로 분류된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녀야 했다.[20] 교육 언어는 핀란드어였으며, 핀란드 민족주의와 종교적 주제에 중점을 둔 교육이 이루어졌다.[14][20] 만약 아이들이 핀란드어와 상당히 다른 러시아어나 베프스어만을 구사하는 경우, 카렐리야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통역사로 활용되었다.[14] 1942년 말까지 110개의 초등학교가 개교했으며, 10,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재학했다.[16]
군정청의 목표 중 하나는 소련 통치 하에서 완전히 억압되었던 종교 활동을 부활시키는 것이었다.[21] 이러한 정책은 "민족"으로 분류된 주민들 사이에서 반공산주의 감정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16]
4. 4. 계획된 인구 이동

동카리알라 지역은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1941년에는 약 85,000명만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전쟁 전 인구 약 300,00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였다.[16] 남은 인구는 대부분 여성, 어린이, 노인이었다. 핀란드 당국은 이들 중 절반 정도를 카렐리안, 핀란드인, 에스토니아인, 잉그리아인, 베프스인 등 "민족" 또는 "동족"(''heimo'')으로 분류했다.[16][17] 나머지 절반은 주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으로 구성된 "비민족"으로 간주되었다.[17] 하지만 언어와 민족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분류는 쉽지 않았으며,[17] 때로는 사이비 과학적인 인류학 이론에 기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만 사용하는 카렐리안이나 다민족 가정의 아이들도 "민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다.[16][17] 핀란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비민족" 인구를 독일 점령 러시아 지역으로 추방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16]
계획된 추방으로 발생할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는 동카리알라 지역에 새로운 주민을 정착시킬 여러 방안을 구상했다. 대부분의 제안은 러시아 내 특정 핀족 소수 민족을 이주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22] 특히 17세기 잉그리아 전쟁과 스톨보보 조약 이후 케스크홀름 군과 스웨덴령 잉그리아에서 트베리 주로 이주했던 카렐리아인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고려되었다.[3] 1926년 소련 인구 조사에 따르면 트베리 주의 카렐리아인 인구는 14만 명이 넘어, 당시 카렐리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KFSSR)의 카렐리아인 인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핀란드군과 독일군 전선이 스비르 강에서 만나야 실현 가능했는데, 전쟁 중 두 군대는 스비르 강에서 만나지 못해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동카리알라에 정착시킬 또 다른 주요 대상은 레닌그라드 주의 잉그리아 핀족이었다.[3] 1926년 인구 조사에서 약 11만 5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나,[23]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 동안 수만 명이 사망하거나 소련 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24] 1941년 레닌그라드 지역의 잉그리아인 수는 약 8만~9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1941년 가을, 독일군이 서부 및 중부 잉그리아를 점령하면서 이 지역은 독일 군정 하에 놓였다. 독일은 동부 일반 계획에 따라 잉그리아를 독일인 식민지(''잉게르만란드'')로 만들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독일과 핀란드 당국은 잉그리아에서 핀족 및 기타 소수 민족(보트인, 이조라인 등)을 이주시키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1943년 3월부터 1944년 여름까지 시행되어 64,000명 이상의 잉그리아인이 핀란드로 이주했다.[25] 한편, 아직 소련군 통제 하에 있던 잉그리아 지역의 주민 약 2만~3만 명은 1942년에서 1943년 겨울 사이 시베리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전쟁 후 모스크바 휴전에 따라 약 55,000명의 잉그리아인이 소련으로 송환되었지만, 1950년대까지 고향인 레닌그라드 주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등 차별을 겪었다.[26] 약 7천~8천 명의 잉그리아인은 소련 당국의 송환을 피해 핀란드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했다.[26]
이 외에도 동카리알라 정착민의 출처로 미국과 캐나다의 핀란드 이민자,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핀족 계열의 소련 전쟁 포로, 당시 핀란드에 거주하던 동카리알라 출신 난민, 그리고 핀란드 참전 용사 등이 논의되었다.[3] 토지 재분배 계획도 세워졌는데, 농지나 토지가 없는 사람, 전쟁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참전 용사, 전직 부사관, 국경 예거 부대원, 그리고 전투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분배할 예정이었다.[3]
4. 5. 강제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
핀란드가 카렐리야를 점령한 초기, 현지에 거주하던 러시아계 주민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2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소와 노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 1941년 말에는 수감된 인원이 2만 4천 명까지 늘어났다. 이후 수감자들은 점차 풀려나 비어있는 마을로 이주되었지만, 이들의 이동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러시아계 주민에게는 빨간색 통행증이 발급되었고, "민족"으로 분류된 이들에게는 녹색 통행증이 주어졌다. 또한, 러시아계 주민들은 핀란드 본토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27]
핀란드 점령 하의 수용소 생활은 매우 열악했다. 특히 1942년 봄과 여름 사이에는 4,0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민간인 수감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주로 1941년의 흉작으로 인한 기아 때문이었다.[28][29] 더불어 카렐리아인과 러시아인 사이에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러시아계 주민들의 큰 불만을 샀다. 이러한 억압적인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많은 현지 러시아계 주민들이 소련 빨치산의 활동을 지지하는 배경이 되었다.
5. 계획된 미래 확장
1941년 11월 27일,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핀란드 외무장관 롤프 비팅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핀란드 국경선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핀란드 국경은 콜라반도에서 스비르 강까지 확장되며, 만약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계획대로 파괴될 경우 네바 강까지 확장될 예정이었다.[1] 핀란드 내에서는 이 이론적인 국경선을 "세 지협의 국경"(Kolmen kannaksen raja|콜멘 칸낙센 라야fin)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카렐리야 지협, 올로네츠 지협, 백해 지협을 의미한다. 백해 지협의 정확한 경계는 전쟁 중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나, 나치 독일의 점령 동부 지역 제국부(RMfdbO) 장관이었던 알프레드 로젠베르크는 핀란드가 KFSSR 전체를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0]
전쟁 이전부터 핀란드 장교단 사이에서는 더 동쪽으로 국경을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가장 동쪽으로 제시된 안은 아르한겔스크주의 니멩가에서 오네가호의 푸도슈스키 구를 잇는 선이었다.[31] 한편, 점령 동부 지역 제국부 소속의 게르하르트 폰 멘데 교수는 핀란드의 극우 활동가 에르키 라이크쾨넨과 접촉하여 핀란드의 "자연스러운" 동쪽 국경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핀란드와 독일 사이의 북동쪽 국경이 아르한겔스크 인근의 북드비나 강(Vienanjoki|비에난요키fin)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로젠베르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32]
콜라반도는 사실상 핀란드 영토로 편입될 계획이었으나, 이 지역의 풍부한 니켈 매장량은 독일과 공동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33] 핀란드의 얄마리 야코올라는 자신의 저서 ''Die Ostfrage Finnlands|디 오스트프라게 핀란츠deu''에서 이 지역에서 약 20만 명의 러시아인을 추방하고, 핀란드인, 사미족, 카렐리야인 약 2만 명만 남기는 인종 청소 계획을 구상하기도 했다.[34]
6. 참고 문헌
- 라우탈라, 아리 (2002). 1941년 동카리알라 점령. 위베스퀼레: 구메루스. ISBN 951-20-6161-9.
참조
[1]
서적
Finland in the Second World War: between Germany and Russia
Palgrave Macmillan
[2]
서적
Implementing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armed conflicts: the case of Finland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
학위논문
”Sisaret tapaavat toisensa” Itä-Karjala ja Suur-Suomi-suunnitelmat neljässä suomalaisessa sanomalehdessä kesäkuusta joulukuuhun 1941
http://joypub.joensu[...]
University of Joensuu
2010-07-20
[4]
학위논문
Suur-Suomen aate ja Itä-Karjala
https://docplayer.fi[...]
University of Tartu
2010-07-20
[5]
웹사이트
I will not sheath my sword before law and order reigns in the land, before all fortresses are in our hands, before the last soldier of Lenin is driven not only from Finland, but from White Sea Karelia as well.
http://heninen.net/m[...]
[6]
웹사이트
Mannerheim – Eastern Karelia
http://www.mannerhei[...]
[7]
문서
Helmi Suomen maakuntien joukossa
[8]
문서
[9]
웹사이트
Etusivu
https://kansallisbio[...]
2020-09-21
[10]
문서
[11]
문서
[12]
문서
[13]
웹사이트
Cartographica Neerlandica Topographical names for Ortelius Map No. 160
http://www.orteliusm[...]
[14]
문서
[15]
문서
[16]
문서
[17]
문서
[18]
문서
[19]
문서
[20]
문서
[21]
문서
[22]
문서
[23]
서적
Ethnic cleansing in the USSR, 1937–1949
Greenwood Publishing Group
[24]
문서
[25]
문서
[26]
문서
[27]
문서
[28]
웹사이트
"Равнение на Победу" (Eyes toward Victory), the Republic of Karelia
"//www.ravnenie-na-p[...]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National Delphi Council of Russia
2006-08-10
[29]
서적
Suur-Suomen kahdet kasvot
Otava
[30]
문서
[31]
문서
[32]
서적
Suur-Suomen ääriviivat
[33]
문서
[34]
문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