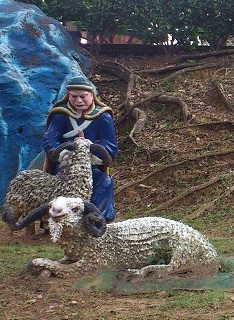소무 (전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소무는 전한 시대의 인물로, 흉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19년 동안 억류되었지만 절개를 지켜 귀환한 인물이다. 흉노와의 화친을 위해 파견된 그는 흉노의 반역 사건에 연루되어 귀순 권유를 거부하고 고초를 겪었다. 이후 전한으로 돌아와 높은 벼슬을 받았지만, 아들의 모반 연루 및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소무는 충절의 상징으로 칭송받았으며, 그의 일화는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기원전 60년 사망 - 유언 (한구절후)
유언은 전한 선제의 아들로 한구후에 봉해졌으며 사망 후 그의 작위는 아들에게 계승되었다. - 기원전 60년 사망 - 유동 (악향헌후)
유동은 전한 시대의 인물로 악향후에 봉해졌으며 기원전 60년에 사망하여 헌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의 아들 유괴가 작위를 계승했다. - 전한의 관내후 - 병창
병창은 전한 시대에 관내후를 계승하고 중랑장, 박양후, 태상을 지냈으나 동군태수로 좌천되어 사망한 인물로, 그의 행적은 《한서》에 기록되어 있다. - 전한의 관내후 - 이저
이저는 전한 시대 경제를 섬긴 인물로, 무제 시기 강노장군으로서 흉노 정벌에 공을 세워 관내후에 봉해졌으며, 이후 여러 전투에서 흉노를 무찌르고 좌풍익을 지냈다. - 전한의 관료 - 구독
구기(緱起)는 전한 시대에 기후(騎虎)에 봉해지고 태상(太常)을 역임한 인물로, 기원전 32년 사망 후 그의 아들 구숭(求崇)이 기후 자리를 계승했다. - 전한의 관료 - 석편
석편은 전한 시대의 관료로, 기원전 138년에 내사에 임명되어 석경의 뒤를 이어 내사를 지냈으며, 정당시가 그의 후임자이다.
| 소무 (전한) - [인물]에 관한 문서 |
|---|
2. 생애
아버지 소건(蘇建)의 임자 덕분에 형제들과 함께 낭(郎)이 되었으며, 관직 경험을 쌓아 이중구감(栘中廄監)의 자리에 올랐다.
천한 원년(기원전 100년), 흉노의 저제후 선우가 전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억류했던 한나라 사신들을 돌려보내자, 무제 역시 이에 화답하여 흉노 사신들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때 소무는 중랑장으로서 이 임무를 맡아 부절(符節, 사신의 신표)을 가지고 장승(張勝), 상혜(常惠) 등과 함께 흉노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흉노 도착 후, 과거 흉노에 투항했던 위율(衛律)을 암살하려던 계획이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획에 부사(副使) 장승이 연루되었고, 이로 인해 소무를 포함한 사절단 전체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소무는 흉노의 귀순 권유를 단호히 거부하고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저제후 선우는 그의 절개를 높이 사면서도 귀순하지 않자, 그를 북해(北海, 지금의 바이칼호) 근처 황무지로 보내 양을 치게 했다. 이때 선우는 "숫양이 젖을 낳으면 돌려보내주겠다"고 조롱하며 사실상 종신 유배를 선고했다.
소무는 흉노 땅에서 19년간 억류 생활을 하게 된다. 식량이 부족하여 들쥐를 잡거나 풀 열매를 따 먹으며 연명했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한나라 사신으로서의 충절을 상징하는 부절을 항상 지팡이처럼 짚고 다녀 그 깃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다. 흉노에 투항했던 옛 동료 이릉(李陵)이 찾아와 회유했지만, 소무는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그의 굳은 의지에 감탄한 이릉은 이후 남몰래 소무를 도왔다.
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소제가 즉위한 후, 한나라와 흉노는 다시 화친을 맺었다. 흉노 측은 소무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했지만, 과거 소무의 부하였던 상혜의 기지로 소무의 생존 사실이 한나라에 알려졌다. 결국 흉노는 소무의 귀국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시원 6년(기원전 81년), 19년 만에 한나라로 돌아온 소무는 전속국(典屬國)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고국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한 상태였다. 오랜 세월 절개를 지킨 소무는 조정에서 높은 명망을 얻었다.
이듬해, 아들 소원(蘇元)이 상관걸(上官桀)과 상홍양(桑弘羊)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소무 역시 연좌될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권력자였던 곽광(霍光)의 도움으로 파면되는 선에서 그쳤다.
소제 사후 선제 옹립에 공을 세워 관내후에 봉해졌고, 이후 장안세(張安世)의 추천으로 우조(右曹)·전속국으로 복직했다.
신작 2년(기원전 60년), 80여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선제는 소원의 죽음으로 소무의 대가 끊긴 것을 안타깝게 여겨, 소무가 흉노에 억류되었을 때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소통국(蘇通國)을 한나라로 불러들여 낭(郎)으로 삼았다. 소무는 훗날 기린각에 공신 중 한 명으로 초상화가 걸리게 된다.
2. 1. 흉노 파견
천한 원년(기원전 100년), 흉노의 선우인 저제후(또는 계제후)는 전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며 이전에 억류했던 한나라 사신 노충국(路充國) 등을 돌려보냈다. 이에 무제 역시 호응하여 한나라에 억류 중이던 흉노 사신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당시 중랑장이었던 소무는 이 송환 임무를 맡아 부절(符節, 사신의 신표)을 지니고 부사(副使) 장승 및 상혜 등과 함께 흉노로 파견되었다.그러나 소무 일행이 흉노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저제후 선우는 이전보다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때마침 흉노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한나라에서 흉노로 투항했던 위율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흉노의 구왕(緱王)과 위율과 마찬가지로 한나라 출신 항장이었던 우상(虞常) 등이 이를 공모했다. 이들은 위율을 암살하고 선우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한나라로 돌아가려 했으나,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다. 선우는 즉시 돌아와 교전 끝에 구왕을 죽이고 우상을 사로잡았다.
저제후 선우는 위율에게 사건의 심리를 맡겼다. 그런데 부사 장승은 소무 몰래 구왕과 우상의 계획을 알고 지원하고 있었다. 우상이 심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불 것을 두려워한 장승은 그제야 소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무는 자신이 연루될 상황에 처하자 책임을 지고 자결하려 했으나, 장승과 상혜가 말려 그만두었다.
결국 소무를 포함한 한나라 사절단은 사건에 연루되어 문초를 받게 되었다. 우상은 고문 끝에 장승과의 공모 사실을 자백했고, 선우는 우상을 공개 처형하고 사절단 전체에게 흉노에 귀순할 것을 강요했다. 장승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항복했다. 위율은 소무에게 다가가 칼을 목에 겨누며 선우의 신하가 되는 것이 큰 영광일 것이라며 회유했지만, 소무는 장승의 배신을 꾸짖으며 끝까지 귀순을 거부했다. 소무는 다시 한번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결을 시도했다.
저제후 선우는 소무의 강직한 절개와 용기에 감탄하여 급히 의사를 불러 그를 치료하게 했다. 소무가 회복되자 선우는 다시 한번 귀순을 권유했으나, 소무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그를 창고에 가두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 소무는 며칠 동안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먹고, 부절에 달린 깃털 장식을 씹어 삼키며 버텼다. 그의 굳은 의지에 놀란 선우는 소무를 죽이지 않고 북해(北海, 현재의 바이칼호) 근처의 황무지로 보내 양을 치게 하면서, "숫양이 젖을 낳으면 그때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조롱했다. 상혜를 비롯한 다른 사절단원들도 각지로 흩어져 억류되었고, 장승은 이미 흉노에 항복한 상태였다.
2. 2. 억류 생활
천한 원년(기원전 100년), 흉노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소무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억류된다. 당시 흉노에 투항해 있던 한나라 출신 우상(虞常) 등이 위율을 암살하고 선우의 모친을 협박하여 한나라로 돌아가려 모의했는데, 소무의 부하였던 장승(張勝)이 이 계획에 연루되었다. 계획이 발각되자 장승은 뒤늦게 소무에게 사실을 알렸고, 소무 또한 연좌되어 문초를 받게 되었다.[2] 소무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결을 시도했으나 위율 등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흉노의 선우 저제후는 소무에게 투항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고 회유했으나, 소무는 끝까지 한나라 신하로서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선우는 소무를 지하 토굴이나 창고에 가두고 음식과 물을 끊어 굶겨 죽이려 했다. 소무는 며칠 동안 눈(雪)과 자신의 옷에 달린 털 장식 등을 씹어 먹으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의 강인한 모습에 선우는 그를 신(神)이 돕는 인물이라 여기며 놀라워했다고 한다.[2]
결국 선우는 소무를 북해(北海, 오늘날의 바이칼호) 근처의 황무지로 유배 보내 숫양(수컷 양) 떼를 돌보게 했다. 그러면서 "숫양이 젖을 낳으면 한나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조롱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비참했다. 식량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풀뿌리나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해야 했다.[2] 그럼에도 소무는 한나라 사신임을 상징하는 부절(符節, 節|절중국어)을 항상 지팡이 삼아 짚고 다녔으며, 시간이 흘러 그 깃털 장식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자신의 신분과 절개를 잊지 않았다.[2]
유배 생활 중, 과거 한나라에서 함께 일했으나 흉노에 투항했던 장수 이릉이 선우의 명으로 소무를 찾아왔다. 이릉은 소무에게 그의 형제들이 죄에 휘말려 자결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며,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하며 투항을 권유했다. 그러나 소무는 흔들리지 않고 거절했다. 이후 이릉은 다시 찾아와 무제의 붕어 소식을 알렸고, 소무는 고국 쪽인 남쪽을 바라보며 피를 토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한다.[2] 이릉은 소무의 굳은 절개에 감탄하여 이후 남몰래 소무에게 음식과 의복 등을 보내며 도왔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선우가 소무에게 흉노 여인을 아내로 주어 그 사이에서 아들(소통국)을 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2] 소무는 이러한 온갖 고초를 겪으며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흉노 땅에 억류되어 있었다.
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소제가 즉위한 후, 한나라와 흉노는 다시 화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때 한나라 사신이 흉노에 소무의 생사를 물었으나, 흉노 측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과거 소무의 부하였던 상혜가 몰래 한나라 사신에게 소무가 살아있음을 알렸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흉노의 선우도 더 이상 소무를 붙잡아 둘 명분이 없어져 마침내 그의 귀국을 허락하게 된다. 이는 시원 6년(기원전 81년)의 일이었다.
2. 3. 귀환
무제가 붕어하고 소제가 즉위한 후, 전한과 흉노는 다시 화친 관계를 맺었다. 이때 전한에서 사신을 보내 소무의 안부를 물었으나, 흉노 측에서는 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그러나 소무와 함께 흉노에 왔던 상혜는 비밀리에 전한 사신에게 소무가 살아있음을 알렸다. 상혜의 제안에 따라, 전한 사신은 당시 흉노의 선우였던 호연제(壺衍鞮)에게 "소제께서 사냥 중에 기러기를 쏘아 잡았는데, 그 새의 발에 소무가 도움을 청하는 편지가 묶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놀란 선우 호연제는 소무가 살아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소무와 그의 남은 추종자 아홉 명의 귀환을 허락했다. 소무가 흉노에 억류된 지 총 19년 만의 일이었다.
시원 6년(기원전 81년), 마침내 한나라로 돌아온 소무는 전속국(典屬國)이라는 고위 관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다른 사람과 재혼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흉노의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부절을 놓지 않고 절개를 지킨 소무는 조정에서 높은 명망을 얻었으며, '좨주'(祭酒)라 불리며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
2. 4. 귀환 이후
시원 6년(기원전 81년), 19년간의 흉노 억류 생활을 마치고 전한으로 돌아온 소무는 전속국에 임명되었다.[1][2] 그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상태였다.[1][2] 오랜 기간 절개를 지킨 소무는 조정에서 높은 명망을 얻었으며, 좨주(祭酒)라고 불리며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1]이듬해인 기원전 80년, 아들 소원(蘇元)이 상관걸과 상홍양 등이 일으킨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주살되는 비극을 겪었다.[1][2] 상관걸 등과 친분이 있었던 소무 또한 연좌될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 실권자였던 곽광의 비호로 파면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1][2]
소제가 붕어한 후 선제를 옹립하는 데 공을 세워 관내후에 봉해졌다.[1] 이후 장안세의 추천으로 우조(右曹)·전속국으로 복직하였다.[1][2]
신작 2년(기원전 60년), 80여 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1][2] 선제는 아들 소원의 죽음으로 소무의 대가 끊긴 것을 안타깝게 여겨, 소무가 흉노에 억류되었을 때 현지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소통국(蘇通國)을 한나라로 불러들여 낭(郞)으로 삼았다.[1][2] 소무는 선제의 명으로 기린각에 초상화가 걸린 공신 중 한 명이 되었다.[2]
3. 평가
소무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충성을 다한 인물의 전형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이야기는 후대 관리들이 큰 충성심이나 용기를 보여줄 때 자주 인용되었다.[1] 그는 비슷한 처지였으나 항복하지 않고 한나라로 탈출한 장건과 비교되기도 한다.[1]
소무의 삶은 역사 기록에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국 역사 전반에 걸쳐 드라마, 시, 노래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1] 대표적인 예로 중국 전통 음악인 "소무목양"(蘇武牧羊중국어)은 그가 양을 치며 절개를 지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며, 주로 중국 플루트로 연주된다.[1]
3. 1. 논란
소무의 사적 등에 관해서는 『한서』 소무전이 주로 참고된다. 또한, 『문선』에는 이릉이 소무에게 보낸 시 3수와 소무에게 답한 서신, 그리고 소무가 지은 시 4수가 실려 있다. 남송의 엄우는 『창랑시화』에서 "오언시는 이릉·소무에게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현대 일본 작가 나카지마 아츠시의 소설 『이릉』에도 소무가 묘사되어 있다.하지만 소무와 이릉이 주고받았다고 전해지는 시들은 후대의 위작이라는 설 또한 유력하다.
4. 소무의 시
소무의 사적은 주로 『한서』 소무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시는 『문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문선』에는 이릉이 소무에게 보낸 시 3수와 소무가 이릉에게 보낸 답서, 그리고 소무가 지은 시 4수가 실려 있다.[1]
남송 시대의 엄우는 그의 저서 『창랑시화』에서 "오언시는 이릉·소무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하며, 소무와 이릉의 시를 오언시의 기원으로 평가했다. 현대 문학 작품 중에서는 나카지마 아츠시의 소설 『이릉』에서도 소무의 모습이 그려진다.[1]
그러나 소무와 이릉의 시가 후대의 창작이거나 가탁된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전한 시대에는 오언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릉의 시 역시 후대 작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 소식은 「답유면서」에서 소무의 시에 등장하는 "굽어 강・한의 흐름(俯視江漢流)"이라는 구절이 당시 소무가 있었을 장안의 지리적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후세의 작품으로 단정했다.
- 홍매는 『용재수필』에서 이릉의 시에 전한 혜제의 휘(이름)인 '영(盈)' 자가 사용된 점을 근거로, 이 시가 전한 무제 시대의 작품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1]
『문선』에 실린 소무의 시 4수 중 세 번째 시는 다음과 같다.[1]
| 시 4수 (그 셋) | |
|---|---|
| 원문 | 해석 |
| 結髮爲夫妻 | 머리 땋아 부부가 되니 |
| 恩愛兩不疑 | 은애는 서로 의심치 않네 |
| 歡娛在今夕 | 즐거움은 오늘 저녁에 있으니 |
| 嬿婉及良時 | 아름다운 시절에 이르렀네 |
| 征夫懷遠路 | 떠나는 남편은 가는 길을 생각하며 |
| 起視夜何其 | 일어나 밤이 얼마나 되었나 보네 |
| 參辰皆已沒 | 삼신성과 진성이 이미 사라지고 |
| 去去從此辭 | 떠나가 이제 이별하네 |
| 行役在戰場 | 역마살은 전장에 있고 |
| 相見未有期 | 만날 기약 아직 없네 |
| 握手一長歎 | 손을 잡고 한 번 길게 탄식하니 |
| 淚爲生別滋 | 눈물은 생이별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네 |
| 努力愛春華 | 힘써 봄날의 꽃을 사랑하고 |
| 莫忘歡樂時 | 즐거웠던 시절 잊지 말게나 |
| 生當復來歸 | 살아서는 마땅히 다시 돌아오리 |
| 死當長相思 | 죽어서는 마땅히 오래 서로 생각하리 |
5. 기타
소무를 주제로 한 전통 중국 음악 "소무목양"(蘇武牧羊중국어)은 그가 양을 치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며, 주로 중국 플루트로 연주된다. 또한 중국 종이 오리기와 같은 그림에서는 소무가 지팡이를 짚고 양을 치는 모습으로 흔히 묘사된다.
일본의 헤이케 이야기에는 소무와 기러기에 묶인 편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흉노가 소무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소무의 사적에 관해서는 『한서』 소무전이 전해지며, 『문선』에는 이릉이 소무에게 보낸 시 3수와 소무에게 답한 서신, 그리고 소무가 지은 시 4수가 실려 있다. 소무와 이릉이 주고받은 시에 대해 남송의 엄우는 『창랑시화』에서 "오언시는 이릉·소무에게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했다. 나카지마 아츠시의 소설 『이릉』에도 소무가 등장한다.
그러나 소무와 이릉의 시가 후대에 지어진 가짜 작품이라는 설도 유력하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오언시는 전한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릉의 시 역시 후대 작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소식은 「답유면서」에서 소무의 시에 나오는 "굽어 강・한의 흐름"이라는 구절이 장안에서 쓰인 시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후세의 작품이라고 단정했다. 홍매는 『용재수필』에서 이릉의 시에 혜제의 휘인 "영(盈)" 자가 사용된 점을 근거로 무제 시대의 작품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조
[1]
서적
Su Wu's biography in vol.54 of ''Book of Han''
[2]
서적
The Sinitic Civilization Book II: A Factual History Through the Lens of Archaeology, Bronzeware, Astronomy, Divination, Calendar and the Annals
https://books.google[...]
iUniversе
201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