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권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자연의 권리는 자연이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인간의 윤리 및 법 체계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는 인권과 유사하게 자연의 존재 자체에서 권리가 발생한다는 논리에 기반하며, 인류의 생존이 건강한 생태계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자연을 재산이나 자원이 아닌 상호 연결된 지구 공동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서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2000년대 초반부터 헌법, 법률, 판례 등을 통해 법제화가 진행되었으며,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환경법 -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UC 버클리 법학대학원은 189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과로 설립되어 법과대학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 중 하나로서 U.S. 뉴스 & 월드 리포트 기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다양한 법률 간행물 발간 및 연구 센터와 클리닉을 운영하며,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동문들을 배출했다. - 환경법 -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적 평가이며, 1960년대에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는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했다. - 환경 보호 - 생물다양성 감소
생물다양성 감소는 종의 다양성, 유전적 변이, 생물 형태의 상호 작용을 포함하는 지구 생물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 현상으로, 서식지 파괴, 오염, 기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식량, 건강,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전 정책, 경제적 해결책, 국제 협약 등의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 환경 보호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되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인류 중심 개발, 국가의 자원 개발 권리, 환경 보호, 국제 협력을 강조하며 27개의 원칙을 제시한다. - 환경주의 - 오성운동
2009년 베페 그릴로가 설립한 이탈리아의 정치 운동인 오성운동은 직접 민주주의, 반부패, 환경주의, 반체제적 성향을 특징으로 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2013년 총선에서 제2당, 2018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 부상했으나, 이후 지지율 하락과 내부 분열을 겪으며 이념적 스펙트럼과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 환경주의 - 환경과학
환경과학은 대기과학, 생태학, 환경화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합하여 지구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구하는 학제간 학문으로, 20세기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재난을 계기로 발전하여 기후변화 모델링, 청정에너지 개발 등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심화하고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적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 자연의 권리 | |
|---|---|
| 권리의 본질 | |
| 유형 | 법 이론, 윤리학, 정치 |
| 관련 개념 | |
| 관련 개념 | 환경 보호주의, 환경 윤리, 환경 법, 지구 권리, 동물권 |
| 환경 운동 | 딥 에콜로지, 지구 법학, 와일드 로(법) |
| 추가 정보 | |
| 참고 | 환경적 인격성 |
2. 기본 원칙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인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자연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권을 정당화하는 윤리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권리도 정당화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생존 자체가 건강한 생태계에 달려 있다는 두 가지 논리에 기초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가 인간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면, 자연의 본질적인 권리도 자연 세계 자체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논리적 주장이 제기된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 "세속적인 권력의 결정이 아니라 존재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명시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비롯되므로, 자연의 권리 역시 자연의 존재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인간의 법 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주목할 만한 옹호자들로는 토머스 베리(Thomas Berry), 코르맥 컬리넌(Cormac Cullinan),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데이비드 R. 보이드(David R. Boyd)가 있다. 토머스 베리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법 철학 및 윤리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지구의 법을 으뜸으로 여기고 존재 자체의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지지는 인류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통합된 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베리는 존재할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자연 시스템에서 유래한 인간의 웰빙 개념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자연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의 권리라는 법적, 철학적 개념은 자연을 재산이나 자원으로 보는 틀에서 자연을 상호 연결된 지구 공동체 파트너로 보는 틀로 전환을 제시한다.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은 그의 논문 "나무도 서 있어야 할까?"에서 "환경 문제는 [자연] 자체가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세계의 많은 종교 및 영적 전통들은 자연 권리 세계관과 일치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 전통 | 설명 |
|---|---|
| 동양 종교 (도교, 성리학, 불교) | 세상이 부처의 본성 또는 기(氣)로 알려진 에너지의 역동적인 힘의 장이라고 가르친다. |
| 힌두교와 불교 | 업(Karma)은 인류와 지구 및 우주와의 상호 관계를 반영한다. 불교의 "의존적 발생" 개념은 모든 현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 서구 종교 | 구유럽 사회는 대지의 어머니의 화신을 숭배했다. 가이아가 최고 신으로 숭배되었다. 플라톤은 "세계는 실제로 영혼과 지성을 갖춘 살아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주의 질서는 사물에서 궁극적이고 가장 고귀한 완벽성이다"라고 말했다. |
| 가톨릭 |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지구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은 ... 순간의 욕망보다 우리의 미래 행복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정한 환경의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 이슬람 | 코란은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반영한다. 샤리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의 복지"이다. |
| 우분투 | "나는 너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로 대략 번역되며, "우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라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말했다. |
세계인권선언(UDHR)은 자연권과 인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권리 개념의 확장은 마그나 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존 로크의 자연권 논제가 미국 독립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연의 법칙"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진실을 보여주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신성한 권리"를 인정했다.
제러미 벤담은 "동물 창조물이 그들에게서 결코 빼앗길 수 없었을 권리를 폭정의 손에 의해서만 빼앗겼을 수도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는 자연의 "계속적인 존재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바꾸려고" 했다.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노예 제도 폐지에서부터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흑인 민권 운동 등 사회가 잠재적인 새로운 권리 소지자들의 고유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권리를 확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옹호자들은 자연에서의 존재로부터 파생된 권리는 모든 존재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존재에게 고유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제안한다. 토머스 베리는 권리는 "종 특이적이고 제한적"이며, "강에는 강의 권리가 있고", "새에는 새의 권리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인권과 자연권의 공통된 윤리적, 도덕적 토대는 권리의 "공동 위반"이라는 개념을 낳는다. 이는 "정부, 산업 또는 기타 주체가 동일한 행위로 자연의 권리와 인권(원주민 권리 포함)을 모두 위반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는 "자연에게 착취당하는 역할이 아니라 형제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조작자이자 정복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이론화했다.
자연권론자들은 개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장소는 궁극적으로 법원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다. 기존의 사법 제도에서는 법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원고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고적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재판이 이해관계 조정의 장으로 이용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특히, 개발 행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것을 지적할 장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29][30] 자연권론자에 따르면, 자연권 개념을 채택하고 법원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장소로 폭넓게 기능하게 하는 것은, 개발 계획 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 있다.[31]
“인간이 아닌 것”을 원고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타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지만, 자연권론자들은 이미 “법인”과 같은 “인간이 아닌 것”은 법의 세계에서 인간과 나란히 단골손님이 되어 있다고 반론한다. 법인과 유사한 구성을 통해 법이 “지켜야 할 자연 환경”에 대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고, 그 대변자가 법정에 등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생각은 법 기술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한다.[34]
「자연의 권리」 개념은 「동물의 권리」와는 다르다. 「자연의 권리」는 자연 보호 관련 문제를 법정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술론적인 측면이 강하며, 동물 개체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야마무라 쓰네토시에 따르면, 자연의 권리는 일본의 환경권이나 자연향유권과 같은 개념과도 다르다. 환경권은 공해 등에 의한 지역 주민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어 온 개념으로, 일정 지역 주민의 사적 권리로서 지역 환경의 공유와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연향유권 개념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자연의 혜택을 받을 권리」 또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자연을 적정하게 보호할 권리」로 정의되며,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상정하지 않고, 자연이라는 유기적 집합체로부터의 이익을 국민 일반이 받을 권리로 구성되는 것이다.[37]
2. 1. 인간과 자연의 상호 연결성
2008년, 에콰도르 국민들은 자연의 본질적인 권리, 즉 파차마마(Pachamama)를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50] 이는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원주민 권리 운동의 결과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생태계의 부분으로써 감싸안는 수마카우사(sumak kawsay, 스페인어로 "buen vivir", 영어로는 "좋은 삶")의 개념과 일치한다.[51]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인권이 법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논리에 기초한다. 첫째, 인권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윤리가 자연의 권리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생존 자체가 건강한 생태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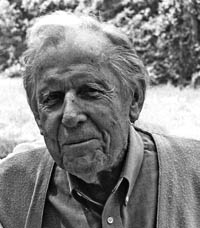
본질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면, 자연의 본질적인 권리도 자연 세계 자체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논리적 주장이 제기된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 "세속적인 권력의 결정이 아니라 존재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명시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의 권리 역시 자연의 존재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인간의 법 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주목할 만한 옹호자들로는 미국의 문화사학자 토머스 베리(Thomas Berry),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호사 코르맥 컬리넌(Cormac Cullinan), 인도의 물리학자이자 환경사회 운동가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그리고 캐나다의 법학 교수이자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R. 보이드(David R. Boyd)가 있다.

토머스 베리는 지구의 법을 으뜸으로 여기고 존재 자체의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법 철학 및 윤리 개념을 제시했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지지는 인류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통합된 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베리는 존재할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자연 시스템에서 유래한 인간의 웰빙 개념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자연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의 권리라는 법적, 철학적 개념은 자연을 재산이나 자원으로 보는 틀에서 자연을 상호 연결된 지구 공동체 파트너로 보는 틀로 전환을 제시한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은 그의 논문 "나무도 서 있어야 할까?"에서 "환경 문제는 [자연] 자체가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위해 인용되었다.
2. 2. 지구법 (Earth Jurisprudence)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인권이 법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권리도 인정되어 인간의 윤리와 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논리에 기초한다. 첫째, 인권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윤리가 자연의 권리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생존 자체가 건강한 생태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본질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면,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의 본질적인 권리도 자연 세계 자체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논리적 주장이 제기된다. 인권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특히,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은 광범위한 범주의 불가침적인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 "세속적인 권력의 결정이 아니라 존재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의 권리 역시 자연의 존재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인간의 법 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주목할 만한 옹호자들로는 미국의 문화사학자 토머스 베리(Thomas Berry),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호사 코르맥 컬리넌(Cormac Cullinan), 인도의 물리학자이자 환경사회 운동가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그리고 캐나다의 법학 교수이자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R. 보이드(David R. Boyd)가 있다.
토머스 베리는 지구의 법을 으뜸으로 여기고 존재 자체의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법 철학 및 윤리 개념을 제시했다. 지구법은 법률 학자, 유엔, 입법자, 철학자, 생태 경제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에 의해 자연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및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지구 중심의 거버넌스의 기초로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정되고 촉진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에 대한 지지는 인류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통합된 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토머스 베리는 존재할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자연 시스템에서 유래한 인간의 웰빙 개념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자연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의 권리라는 법적, 철학적 개념은 자연을 재산이나 자원으로 보는 틀에서 자연을 상호 연결된 지구 공동체 파트너로 보는 틀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상은 인권 운동이 처음에는 권리가 없는 존재의 권리 인정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는 광범위하게 지지되는 세계관으로 성숙한 것과 같은 경로를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은 그의 중요한 논문 "나무도 서 있어야 할까?"에서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으며, 미국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서 "환경 문제는 [자연] 자체가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위해 인용되었다. 크리스토퍼 스톤과 다른 사람들이 설명했듯이, 인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발견"되어 미국 독립 선언문에서처럼 본질적으로 법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자명한" 것으로 선언되었다. 과거와 현재의 인권 운동의 성공은 자연 시스템과 종 개체군을 권리를 가진 실체로 포함하도록 지구 공동체의 범위를 넓히려는 현재의 운동에 대한 교훈을 제공한다.
1972년 미국의 법철학자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이 「나무에도 당사자 적격이 있을까?」(Should Tree Have Standing?)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후술하는 시에라 클럽 대 모튼 사건의 2심 판결에서 원고 측의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한 반응으로, 특히 더글러스 판사에게 소송을 인정하도록 호소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19] 이 논문에서 크리스토퍼 스톤은 권리 개념의 확장과 자연물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논리는 "권리의 주체는 부유층, 남성, 백인 등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점차 그 제한이 해소되고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인류 이외의 존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 상으로는 후견인이나 수탁인으로서의 인간이 "피해자"인 자연물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환경 복원 비용에 충당하거나 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자연물에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현대적 법적 의미에서의 자연물의 위치가 제안되었다.[21][23] 하지만 13년 후 크리스토퍼 스톤은 「나무에도 당사자 적격이 있을까?」에 대한 자기 검토 논문을 발표하여, 미네랄 킹 협곡과 같은 토지에까지 당사자 적격을 즉시 확장한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었다고 반성했다.[24]
3. 역사적 배경
자연권 법리와 운동의 윤리적, 철학적 기반은 자연을 대상이나 재산으로 보는 세계관과 대조되는, 자연 존중의 세계관이다. 원주민법 전문가인 John Borrows는 원주민 법 전통 내에서 창조 이야기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자연과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주민 세계관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포함한 자연권 법의 발전에 부합하며, 그 발전을 가속화했다. 에콰도르는 Pachamama를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헌법을 개정하여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볼리비아 역시 헌법을 개정하고 자연권 법규를 제정하여 전통적인 원주민의 파차마마에 대한 존중과 자연 시스템과 인간이 하나의 가족의 일부라는 세계관을 반영했다.
뉴질랜드 법학자인 캐서린 아이언스 마갈라네스는 전통적인 원주민 세계관에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내재되어 있어 자연이 살아있는 조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자연을 가족 구성원처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자연 세계를 친족으로 여기는 일차적인 책임의 틀을 반영하는 법적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자연권의 원주민적 측면을 신화로 규정하고, 자연권의 일방적인 시행이 원주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3][4][5][6][7][8]
인권은 수세기 동안 발전해 왔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48년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이다. 이러한 권리 발전의 핵심에는 자연권과 인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역사 및 환경 연구 교수인 로데릭 프레이저 내쉬(Roderick Fraser Nash)는 종과 자연 세계에 대한 권리의 역사를 13세기 마그나 카르타로 거슬러 올라가 현대 권리 담론의 기초가 되는 "자연권" 개념의 출현을 추적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 학자인 피터 버든(Peter Burdon)은 내쉬의 분석을 확장하여, 17세기 영국 철학자이자 의사인 존 로크의 혁신적인 자연권 논제가 영국 왕실이 식민지 주민들의 자연권을 부정한다는 개념을 통해 미국 독립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이자 변호사, 철학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신의 법칙"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진실을 보여주며, 특히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와 같은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789년 프랑스의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또한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신성한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정치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리의 확장은 동물에게까지 이어졌으며,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 이론가인 제러미 벤담은 "나머지 동물 창조물이 그들에게서 결코 빼앗길 수 없었을 권리를 폭정의 손에 의해서만 빼앗겼을 수도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언어학자이자 학자인 에드워드 페이슨 에반스(Edward Payson Evans)는 윤리 진화의 역사를 추적하면 상호 권리와 의무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1948년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은 기본적인 인권은 "존재의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에 기초했다. 자연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가 기본 권리에 대한 결정적인 조건이라면, 모든 형태의 존재는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 윤리는 자연의 "계속적인 존재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호모 사피엔스''의 역할을 토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바꾸려고" 했다.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노예 제도 폐지에서부터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흑인 민권 운동 그리고 다른 기본 권리의 인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잠재적인 새로운 권리 소지자들의 고유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권리를 확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범위 확장은 자연 세계를 포괄하도록 계속 확대되어야 하며, 이러한 입장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다.
옹호자들은 자연에서의 존재로부터 파생된 권리는 모든 존재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존재에게 고유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제안한다. 토머스 베리(Thomas Berry)는 권리는 "종 특이적이고 제한적"이며, 즉 "강에는 강의 권리가 있고", "새에는 새의 권리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차이는 "정량적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인권 인정과 마찬가지로 법학자들은 자연의 권리 인정이 인간의 법률과 관행의 틀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인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는 "자연에게 착취당하는 역할이 아니라 형제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조작자이자 정복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이론화했다.
'''자연권''' 사상이 확립되기까지 몇몇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다.[20][21]
| 사건 | 내용 |
|---|---|
| 「나무에도 당사자 적격이 있을까?」 (Should Tree Have Standing?) 논문 발표 (1972년) | 미국의 법철학자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이 발표. 시에라 클럽 대 모턴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권리 개념의 확장과 자연물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언급. "권리의 주체는 부유층, 남성, 백인 등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점차 그 제한이 해소되고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인류 이외의 존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대 모턴(Morton) 사건(en:Sierra Club v. Morton)」 (미국, 1965년 제기) | 환경보호 단체인 시에라 클럽이 월트 디즈니사(Walt Disney Company)의 미네랄 킹 계곡(Mineral King Valley) 개발 계획에 대해 개발 허가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로저스 모턴(Rogers Morton) 내무장관을 고소한 사건. 대법원 판결(1972년)에서 다수 판사는 원고 적격 결여로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윌리엄 더글러스(William O. Douglas) 판사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 제시. 더글러스 판사는 크리스토퍼 스톤의 논문을 인용하며, "이 재판의 원고는 시에라 클럽이 아니라 미네랄 킹 계곡 자체여야 했다"고 주장.[25] |
|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Endangered Species Act) 제정 (미국, 1973년) | 긴급한 자연보호 소송에 대한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여 "누구든지(any person)"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 |
| 파리이라(새의 일종) 명의의 자연보호 소송 (하와이, 1978년) | 인간이 방목한 가축에 의한 자연 파괴를 금지하고 가축을 파리이라 서식지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파리이라 승소. |
3. 1. 원주민 세계관과의 연관성
2008년, 에콰도르 국민들은 자연의 본질적인 권리, 즉 Pachamama를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50] 이는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원주민 권리 운동의 우주론과 행동의 결과였다. 이는 수마카우사(sumak kawsay, 스페인어로 "buen vivir", 영어로는 "좋은 삶")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생태계의 부분으로써 감싸안는 것이다.[51]자연권 법리와 운동의 윤리적, 철학적 기반은 자연 지배라는 세계관(자연을 대상이자 재산으로 보는 관점)과 대조되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세계관이다. 원주민법 전문가인 John Borrows는 "원주민 법 전통 내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자연과 불화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2012년 국제 원주민 선언은 현대 법이 "창조의 자연 질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를 파괴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인간이 "창조의 신성한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지구와 지구가 창조하고 유지하는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일이 진행될 때 지속적인 기쁨을 누린다"고 언급했다.
원주민 세계관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포함한 자연권 법의 발전과 부합하며, 그 발전을 가속화했다. 에콰도르는 자연을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헌법을 개정하여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자연 세계의 물리적, 정신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Pachamama를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볼리비아 역시 헌법을 개정하고 자연권 법규를 제정하여 전통적인 원주민의 파차마마에 대한 존중과 자연 시스템과 인간이 하나의 가족의 일부라는 세계관을 반영했다.
뉴질랜드 법학자인 캐서린 아이언스 마갈라네스는 전통적인 원주민 세계관에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내재되어 있어 자연이 살아있는 조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자연을 가족 구성원처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자연 세계를 친족으로 여기는 일차적인 책임의 틀을 반영하는 법적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자연권의 원주민적 측면을 신화로 규정하고, 자연권의 일방적인 시행이 원주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5][6][7][8]
3. 2. 종교적, 철학적 기반
자연권 법리와 운동의 윤리적, 철학적 기반은 자연을 대상이자 재산으로 보는 세계관과 대조되는, 자연에 대한 존중의 세계관이다. 원주민법 전문가인 John Borrows는 "원주민 법 전통 내에서는 창조 이야기가…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지적하며, 자연과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주민 세계관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를 포함한 자연권 법의 발전에 부합하며, 그 발전을 가속화했다. 에콰도르는 Pachamama를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헌법을 개정하여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볼리비아 역시 헌법을 개정하고 자연권 법규를 제정하여 전통적인 원주민의 파차마마에 대한 존중과 자연 시스템과 인간이 하나의 가족의 일부라는 세계관을 반영했다.뉴질랜드 법학자인 캐서린 아이언스 마갈라네스는 전통적인 원주민 세계관에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이 내재되어 있어 자연이 살아있는 조상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자연을 가족 구성원처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자연 세계를 친족으로 여기는 일차적인 책임의 틀을 반영하는 법적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자연권의 원주민적 측면을 신화로 규정하고, 자연권의 일방적인 시행이 원주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3][4][5][6][7][8]
세계의 많은 다른 종교 및 영적 전통들은 자연 권리 세계관과 일치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동양 종교 및 철학적 전통들은 지구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영성 개념을 포용한다. 중국의 도교와 성리학, 그리고 일본의 불교는 세상이 부처의 본성 또는 기(氣)로 알려진 에너지의 역동적인 힘의 장이라고 가르친다. 11세기 성리학자 철학자 장재(張載)는 "우주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을 내 몸으로 여기고, 우주를 지배하는 것을 내 본성으로 여긴다."라고 설명했다.
힌두교와 불교 모두에서 업(Karma)("행위" 또는 산스크리트어로 "선언")은 인류와 지구 및 우주와의 네트워크화된 상호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다. 불교의 "의존적 발생" 개념은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승불교의 "인드라의 그물"은 무한히 반복되는 상호 관계의 우주를 상징하며,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는다.
서구 종교 및 철학적 전통들 또한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지구와 우주의 맥락을 인식해 왔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구유럽"의 사회는 수많은 여성 신들을 대지의 어머니의 화신으로 숭배했다. 초기 그리스에서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최고 신으로 숭배되었다. 필레보스와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세계는 실제로 영혼과 지성을 갖춘 살아있는 존재이며 (...) 모든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포함하는 단 하나의 보이는 살아있는 실체이며, 그 본질상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주의 질서는 사물에서 궁극적이고 가장 고귀한 완벽성이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구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은 ... 순간의 욕망보다 우리의 미래 행복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후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와 지구의 관계에 대해 "진정한 '환경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인류가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란은 이슬람에서 개인과 공동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 권위이며,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반영한다. 학자들은 샤리아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편적인 공동선, 즉 모든 피조물의 복지"로 묘사한다.
서구와 원주민 전통을 결합하여,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우분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윤리 개념으로 "나는 너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로 대략 번역되며, "우분투는 특히 당신이 고립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했다.
1949년에 출판된,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교수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 군의 연대기』(原題: A Sand County Almanac)[22]에 수록된 "토지 윤리"(原題: Land Ethics)라는 논문에서, "자연은 공동체이며, 토지 윤리는 인간이라는 종의 역할을 토지라는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일원,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고 언급하며 인간 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1972년에 미국의 법철학자 크리스토퍼 스톤은 「나무에도 당사자 적격이 있을까?」(Should Tree Have Standing?)라는 논문을 발표했다.[19] 이 논문에서 스톤은 권리 개념의 확장과 자연물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언급했다.
「동물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는 종종 혼동되지만[35], 「자연의 권리」 개념은 「자연 보호 관련 문제를 법정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술론」이라는 측면이 강하며, 동물 개체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야마무라 쓰네토시에 따르면, 자연의 권리와 일본의 환경권이나 자연향유권과 같은 개념도 다르다. 야마무라에 따르면, 환경권은 지역 주민의 사적 권리로서 지역 환경의 공유와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자연향유권 개념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자연의 혜택을 받을 권리」 또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자연을 적정하게 보호할 권리」로 정의된다.[37]
3. 3. 인권과의 관계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인권이 법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권리도 인정되어 인간의 윤리와 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논리에 기초한다. 첫째, 인권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윤리가 자연의 권리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생존 자체가 건강한 생태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첫째, 본질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면,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의 본질적인 권리도 자연 세계 자체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논리적 주장이 제기된다. 인권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은 광범위한 범주의 불가침적인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인권선언 기초자들은 기본적인 인권 개념이 "세속적인 권력의 결정이 아니라 존재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의 권리 역시 자연의 존재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인간의 법 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주목할 만한 옹호자들로는 미국의 문화사학자 토머스 베리(Thomas Berry),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호사 코르맥 컬리넌(Cormac Cullinan), 인도의 물리학자이자 환경사회 운동가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그리고 캐나다의 법학 교수이자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 보고관 데이비드 R. 보이드(David R. Boyd)가 있다.
토머스 베리는 지구의 법을 으뜸으로 여기고 존재 자체의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법 철학 및 윤리 개념을 제시했다.
둘째, 자연의 권리에 대한 지지는 인류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통합된 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베리는 존재할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자연 시스템에서 유래한 인간의 웰빙 개념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자연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지적했다.
자연의 권리라는 법적, 철학적 개념은 자연을 재산이나 자원으로 보는 틀에서 자연을 상호 연결된 지구 공동체 파트너로 보는 틀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남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톤은 그의 중요한 논문 "나무도 서 있어야 할까?"에서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으며, 미국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서 "환경 문제는 [자연] 자체가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위해 인용되었다.
인권은 수세기 동안 발전해 왔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48년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이다. 이러한 권리 발전의 핵심에는 자연권과 인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이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역사 및 환경 연구 교수인 로데릭 프레이저 내쉬(Roderick Fraser Nash)는 종과 자연 세계에 대한 권리의 역사를 13세기 마그나 카르타로 거슬러 올라가 현대 권리 담론의 기초가 되는 "자연권" 개념의 출현을 추적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지구 법학(Earth Jurisprudence) 학자인 피터 버든(Peter Burdon)은 내쉬의 분석을 확장하여, 17세기 영국 철학자이자 의사인 존 로크의 혁신적인 자연권 논제가 미국 독립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948년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은 또 다른 이정표였으며, 기본적인 인권은 "존재의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에 기초했다. 자연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가 기본 권리에 대한 결정적인 조건이라면, 이러한 결정적인 조건은 단 한 가지 형태의 존재의 권리로 제한될 수 없으며, 모든 형태의 존재는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노예 제도 폐지에서부터 여성에게 투표권 부여, 흑인 민권 운동 그리고 다른 기본 권리의 인정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잠재적인 새로운 권리 소지자들의 고유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권리를 확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옹호자들은 자연에서의 존재로부터 파생된 권리는 모든 존재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존재에게 고유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제안한다. 토머스 베리(Thomas Berry)는 권리는 "종 특이적이고 제한적"이며, 즉 "강에는 강의 권리가 있고", "새에는 새의 권리가 있으며", "인간에게는 인권이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차이는 "정량적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이 점을 확장하면, 인권과 자연권의 공통된 윤리적, 도덕적 토대는 권리의 "공동 위반"이라는 개념을 낳는다. 이는 "정부, 산업 또는 기타 주체가 동일한 행위로 자연의 권리와 인권(원주민 권리 포함)을 모두 위반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텍사코(현재 셰브론)의 석유 시추 작업은 사람들과 자연 시스템의 기본 권리를 모두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인권 인정과 마찬가지로 법학자들은 자연의 권리 인정이 인간의 법률과 관행의 틀을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의 권리' 개념은 '동물의 권리 Animal rights'와는 다르다. 이들은 종종 혼동되지만,[35] 현재 '자연의 권리' 개념은 '자연 보호 관련 문제를 법정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술론'이라는 측면이 강하며, 동물 개체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야마무라 쓰네토시에 따르면, 자연의 권리와 일본의 환경권이나 자연향유권과 같은 개념도 다르다. 야마무라에 따르면, 환경권은 지역 주민 피해 방지라는 관점에서 제기되어 온 개념으로, 일정 지역 주민의 사적 권리로서 지역 환경의 공유와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환경권의 입장에서는 자연 환경은 주체가 아니라 지배 대상이 된다. 반면 자연향유권 개념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자연의 혜택을 받을 권리' 또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자연을 적정하게 보호할 권리'로 정의되며,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상정하지 않고, 자연이라는 유기적 집합체로부터의 이익을 국민 일반이 받을 권리로 구성되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론의 영향도 받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류의 공익권과 그 보호라는 사람을 주체로 한 관점에서 다르다.[37]
3. 4. 주요 인물
| 인물 | 설명 |
|---|---|
| 토머스 베리(Thomas Berry) | 미국의 문화사학자.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개념을 통해 사회의 법은 자연의 법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주장. "우주는 사물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공동체"라고 강조. |
| 코르맥 컬리넌(Cormac Cullinan)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호사. 자연의 권리 옹호. |
|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 인도의 물리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지구법과 지구 민주주의(Earth Democracy) 주장.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 강조. |
| 데이비드 R. 보이드(David R. Boyd) | 캐나다의 법학 교수.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하며 자연의 권리 옹호. |
|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 | 남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 교수. 논문 "나무도 서 있어야 할까?"에서 자연의 권리 주장. 미국 대법원 판결에 영향. |
| 로데릭 프레이저 내쉬(Roderick Fraser Nash) |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역사 및 환경 연구 교수. 자연권 개념의 역사를 마그나 카르타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 |
| 피터 버든(Peter Burdon) | 애들레이드 대학교 법학부 교수. 존 로크의 자연권 이론이 미국 독립 혁명에 미친 영향 분석. |
| 제러미 벤담 | 18~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 이론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주장. |
| 에드워드 페이슨 에반스(Edward Payson Evans) | 19세기 언어학자이자 학자. 윤리적 진화가 모든 생명체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
| 알도 레오폴드 | 토지 윤리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 인간을 토지 공동체의 일원으로 봄. |
|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 | 하버드 대학교 법학 교수. 자연에게 형제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 아르네 네스(Arne Naess) | 심층 생태론 운동 주도. |
| 에보 모랄레스 | 볼리비아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지구 어머니 권리 선언(UDRME) 채택 촉구. |
| 크레이그 카우프만(Craig Kauffman) | 오리건 대학교 정치학 교수. 자연의 권리 운동을 "중요한 새로운 세계 운동"으로 평가. |
4. 비판적 관점
자연권론자들은 개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장소는 궁극적으로 법원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다.[29][30] 고전적인 사법권 개념에 기반한 기존 사법 제도에서는 법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원고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고적격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재판이 이해관계 조정의 장으로 이용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즉, 이해관계를 조정할 장소가 사라져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특히 개발 행위에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이를 지적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연권론자들은 자연권 개념을 채택하여 법원이 이해관계 조정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개발 계획처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큰 장점이 있다고 본다.[31] 감정적 대립을 없애고 합리적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신뢰는 근대 국가에 필수적이며, 자연 보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32]
"인간이 아닌 것"을 원고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동물 등이 법정에 등장해 인간의 언어로 재판에 참가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판타지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33] 이에 대해 자연권론자들은 법인처럼 "인간이 아닌 것"이 법 세계에서 인간과 나란히 주체로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법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cf.→법인본질론),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연 환경"에 원고적격성을 인정하고 그 대변자가 법정에 서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 기술적인 제안이며, "자연권"은 판타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론한다.[34]
4. 1. 인간 중심적 법 체계의 한계
자연 보호를 위한 법 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법적, 경제적 체계가 자연을 이윤과 인간의 욕구를 위해 훼손될 수 있는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연을 경제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이미 일부 생태계와 종을 훼손하여, 정책 전문가들이 어떤 종을 포기할지 결정하는 "멸종위기종 분류"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0세기와 21세기의 환경법은 생태계와 종에 어느 정도 보호를 제공하지만, 자연이 인간 중심적이고 경제적 이익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는 전반적인 환경 악화를 막거나 되돌리지 못한다고 주장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멸종위기종법은 종 개체 수가 멸종으로 향할 때만 활성화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우선시한다. 반면, "건강한 종 보호법"은 번영하는 종 개체군 달성을 우선시하고 종 보존을 추진하는 경제 체제를 촉진할 것이다.
2000년 유럽 연합의 물 관리 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은 모든 EU 수역의 "양호한 상태"를 목표로 하며, 필요한 "생태적 유량"을 고려한다. 그러나 지침 채택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태적 유량"에 대한 EU의 정의나 계산 방법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는 여전히 없다. 자연의 권리 관점은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기존의 물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수로가 적절하고 시기적절하며 깨끗한 물의 흐름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고, 그러한 기본적인 생태적 유량의 필요를 그에 따라 정의할 것이다.
1949년 출판된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 군의 연대기』에 수록된 "토지 윤리"라는 논문에서는 "자연은 공동체이며, 토지 윤리는 인간이라는 종의 역할을 토지라는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일원,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고 언급하며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했다.[22]
1972년 크리스토퍼 스톤은 「나무에도 당사자 적격이 있을까?」라는 논문에서 권리 개념의 확장과 자연물의 당사자 적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권리의 주체는 부유층, 남성, 백인 등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점차 그 제한이 해소되고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인류 이외의 존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9]
4. 2. 과학적, 윤리적 근거
자연의 권리 옹호자들은 인권이 법적으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자연의 권리도 인정되어 인간의 윤리와 법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논리에 기초한다. 첫째, 인권을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윤리가 자연의 권리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생존 자체가 건강한 생태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첫째 논리는, 본질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면, 마찬가지로 자연 세계의 본질적인 권리도 자연 세계 자체의 존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인권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어 왔으며,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UDHR)은 광범위한 범주의 불가침적인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 "세속적인 권력의 결정이 아니라 존재의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적인 인권이 인간의 존재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의 권리 역시 자연의 존재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인간의 법 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주목할 만한 옹호자들로는 토머스 베리(Thomas Berry), 코르맥 컬리넌(Cormac Cullinan),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데이비드 R. 보이드(David R. Boyd)가 있다.
토머스 베리(Thomas Berry)는 지구의 법을 으뜸으로 여기고 존재 자체의 사실로 인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이라는 법 철학 및 윤리 개념을 제시했다. 지구법은 법률 학자, 유엔, 입법자, 철학자, 생태 경제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에 의해 자연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및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지구 중심의 거버넌스의 기초로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인정되고 촉진되고 있다.
둘째 논리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지지는 인류가 장기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 세계의 통합된 공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리주의적(Utilitarian)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토머스 베리(Thomas Berry)는 존재할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자연 시스템에서 유래한 인간의 웰빙 개념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며, 자연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스톤은 그의 논문 "나무도 서 있어야 할까?"에서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으며, 미국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서 "환경 문제는 [자연] 자체가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위해 인용되었다.
앨도 레오폴드(Aldo Leopold)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서의 땅"을 볼 때, "우리가 소유한 상품"으로 보기보다는 "사랑과 존중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레오폴드는 "생물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알베르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삶과 "삶의 의지"에 대한 존경을 인식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정의했다.

세계의 많은 다른 종교 및 영적 전통들은 자연 권리 세계관과 일치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동양 종교 및 철학적 전통들은 지구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영성 개념을 포용한다. 중국의 도교와 성리학, 그리고 일본의 불교는 세상을 부처의 본성 또는 기(氣)로 알려진 에너지의 역동적인 힘의 장이라고 가르친다. 성리학자 장재(張載)가 설명했듯이, "우주 전체에 걸쳐 있는 것을 내 몸으로 여기고, 우주를 지배하는 것을 내 본성으로 여긴다."
힌두교와 불교 모두에서 업(Karma)은 인류와 지구 및 우주와의 네트워크화된 상호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다. 불교의 "의존적 발생" 개념은 마찬가지로 모든 현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승불교의 "인드라의 그물"은 무한히 반복되는 상호 관계의 우주를 상징하며, 어떤 것도 지배하지 않는다.
서구 종교 및 철학적 전통들 또한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어 지구와 우주의 맥락을 인식해 왔다. 필레보스와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은 "세계는 실제로 영혼과 지성을 갖춘 살아있는 존재이며 (...) 모든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포함하는 단 하나의 보이는 살아있는 실체이며, 그 본질상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인간의 위치가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를 기본으로 하는 통합된 전체의 일부임을 언급하며, "우주의 질서는 사물에서 궁극적이고 가장 고귀한 완벽성이다"라고 말했다.
최근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지구의 목소리에 대한 순종은 ... 순간의 욕망보다 우리의 미래 행복에 더 중요하다. 우리의 지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남고 싶다면 그것을 듣고 그 메시지를 해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후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와 지구의 관계에 대해 "진정한 '환경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인류가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란은 이슬람에서 개인과 공동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 권위이며,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반영한다. 학자들은 샤리아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편적인 공동선, 즉 모든 피조물의 복지"로 묘사한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윤리 개념으로 "나는 너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로 대략 번역되며, 우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5. 법제화 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헌법 조항, 조약, 국가 및 지방 법규, 지역 법률, 법원 판결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의 권리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22년 기준으로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의 최소 7개 부족 국가, 미국 전역의 60개 이상의 도시와 카운티를 포함하여 24개국에서 자연의 권리 법이 존재한다. 2022년에는 기존 또는 계류 중인 자연의 권리 법 조항이 있는 국가가 총 29개국으로 늘어났다.
2000년대 초반, 더욱 강력하고 활동적인 초국가적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원칙들이 법률로 채택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토착민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를 모두 진전시키기 위한 토착민의 리더십, 물에 대한 인권과 같은 국제적 사회 운동, 야생화와 같이 자연의 권리 틀과 일치하는 실용적인 해결책의 발전,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 운동 허브 개발 등 다른 시스템 변화 이니셔티브 및 인권 운동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발생했다.
자연의 권리 법률 이행을 위해 비영리 단체인 자연의 권리를 위한 세계 동맹(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은 "국제 자연 권리 재판소"를 설립했다. 이는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이며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발표한다. 재판소는 상설인민재판소와 유사한 절차에 자연의 권리, 인권 및 토착민의 권리 옹호자들을 모은다.
자연의 권리 법률과 판례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법학자 및 다른 학자들이 이러한 법률의 광범위한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분석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연의 권리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전국자연보호연합의 자연 권리 선언 채택이 초기 사례이다. 1995년에 제기된 "아마미 자연의 권리 소송"은 자연의 권리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첫 소송으로 평가받는다.[38] 이 소송에서는 아마미노쿠로우사기 등 동물 4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으나, 법원은 동물에게 법적 권리 주체성이 없다며 소장을 각하했다. 이후에도 여러 "자연의 권리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자연물 자체에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40]
자연의 권리론자들은 이러한 소송 활동이 법정 투쟁 방식, 특히 법원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가미오오제키 소송에서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원고 적격을 이유로 소송 각하를 요구하는 가나가와현에 대해 "실체적 반론을 하도록" 지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4년에는 오키나와 헤노코에 건설 예정인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듀공 등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42] 이 소송은 2008년에 원고 측 승소 판결[43]을 받았으며, 이는 "미국이 시민 소송 조항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최초의 자연의 권리에 근거한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국내에서 원고 측이 '자연의 권리' 개념을 활용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던 초기 대표적인 소송은 다음과 같다.[45]
5. 1. 국제적 동향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범주에 걸친 불가침의 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수십 년 후, USC 법학 교수 크리스토퍼 스톤(Christopher Stone)은 법적 역사 전반에 걸친 "권리의 연속적인 확장"과 일치하게 자연 세계의 법적 지위와 관련 권리의 인정을 촉구했다.스톤의 법률 연구 외에도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자연의 권리 운동을 주도한 요인으로는 토착민의 관점과 토착민 권리 운동의 활동, 아르네 네스(Arne Naess)의 저술과 심층 생태론 운동, 토마스 베리(Thomas Berry)의 2001년 자연법을 "주요 텍스트"로 인정하자는 법리적 촉구, 2003년 코맥 컬리넌(Cormac Cullinan)의 야생법(Wild Law) 책 출판과 이후 영국에서 동명의 법률 협회 설립, 법적 기업 인격 확장을 통한 기업 권력에 대한 우려 증가, 미국 지역사회에서 자연의 권리를 다루는 지역 법률의 채택, 2010년 자연 권리 글로벌 연합(GARN) 설립, 그리고 종 손실, 생태계 파괴 및 기후 변화의 실존적 위협에 대한 전 세계적 우려 증가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2010년 지구 어머니 권리 선언(UDRME)의 개발을 지원했다. UDRME는 볼리비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와 지구 어머니의 권리에 관한 세계 시민 회의에서 130개국 대표들이 채택했다. 이 회의는 2009년 코펜하겐 기후 협상의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따라 개최되었다.
볼리비아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는 당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게 유엔이 UDRME 채택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 권고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UDRME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2012년 자연의 권리에 관한 세계 선언 제안 결의안 등 다른 국제적 및 국가적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2021년 현재 자연의 권리는 모든 정부 수준의 조약, 헌법, 법원 판결, 법률 및 행정법에 반영되었다. 오리건 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자연의 권리와 세계 거버넌스 학자인 크레이그 카우프만(Craig Kauffman)은 진화하는 자연의 권리 이니셔티브와 네트워크는 "정부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이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낙담한 시민들이 건설하는 ... 비공식적 세계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새로운 세계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2021년에는 "변호사, 우주 고고학자 및 우려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그룹이 자연의 권리 운동의 선례와 우주에 있는 비인간 실체에 대한 법적 인격 개념을 바탕으로 "달의 권리 선언"[9]을 만들었다.[10][11]
1973년 미국에서 제정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Endangered Species Act)에서는 긴급한 자연보호 소송에 대한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여 “누구든지(any person)”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1978년 하와이에서 파리이라(새의 일종) 명의로 인간이 방목한 가축에 의한 자연 파괴를 금지하고 가축을 파리이라 서식지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자연보호 소송이 최초의 사례였다. 이 소송에서 파리이라는 승소하였고, 파리이라 서식지에서 가축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2004년에는 오키나와의 헤노코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사업에 관하여,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인간이 아닌 동물 종인 “듀공”등에 의해, 시민 소송 조항의 본고장인 미국의 국방부·럼즈펠드 국방장관에 대해, 듀공의 서식지를 포함한 오키나와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다.[42] 2008년 1월 24일에 원고 측 승소 판결[43]이 나왔다.
5. 2. 에콰도르 헌법
2008년, 에콰도르 국민들은 Pachamama를 인정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50] 이는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원주민 권리 운동의 결과였다. 이 헌법 개정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수마카우사(sumak kawsay, 스페인어로 "buen vivir", 영어로는 "좋은 삶") 개념과 일치한다.[51]원주민 세계관은 에콰도르의 자연권 법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에콰도르는 자연을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헌법을 개정하여 자연의 권리를 인정했다. 이는 자연 세계의 물리적, 정신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 Pachamama를 더 잘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5. 3.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 자연의 권리 개념이 소개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38] 전국자연보호연합의 자연 권리 선언 채택이 초기 사례이다.실제로 자연의 권리론이 소송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95년(헤이세이 7년) 제기된 "아마미 자연의 권리 소송"(아마미노쿠로우사기 소송)이 처음이다.[38] 이 재판에서는 자연보호활동가 A를 비롯해 "아마미노쿠로우사기" 등 동물 4종이 원고로서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가고시마 지방법원은 동물에게 법적 권리 주체성(당사자능력)이 없고, "아마미노쿠로우사기" 등의 기재는 무의미하다며 소장을 각하했다. 그러자 원고 A는 인간 원고인 "A"에 대해 "아마미노쿠로우사기 즉 A"라고 하는 등의 표시 정정을 했다. 이는 자연물의 대변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자연의 권리론을 강조하는 취지였다.[38] 이후 소장은 수리되었고 A 등 인간 원고에 대한 판결이 나왔지만, 법원은 자연의 권리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객관소송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며[38] 원고 적격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각하 판결로 끝났다.[41] 1993년 제기된 사가미오오제키 소송도 자연의 권리 사상을 원용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후 몇몇 "자연의 권리 소송"이라는 이름의 소송, 또는 사상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고 적격에 문제가 없는 주민 소송 형태의 사건에서도, 문제 제기를 위해 자연물을 원고로 추가하는 사례가 있다.[40]
자연물을 원고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물 자체에 당사자 능력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따라서 실제로 자연물을 원고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자연물 원고 부분에 대해 소장 각하 또는 변론을 분리하여 소송 각하 등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자연의 권리 소송은 해석론상의 무리를 감수하고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된다.[40]
자연의 권리론자들은 이러한 소송 활동이 점차 자연 보호에 관한 법정 투쟁의 방식(주로 법원 측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사가미오오제키 소송에서 요코하마 지방법원의 소송 지휘를 보면, 자연물 원고를 부정하고 원고 적격을 이유로 소송의 각하를 요구하는 가나가와현에 대해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실체적 반론을 하도록"이라는 소송 지휘를 했다고 교도 통신(1996-02-28-15:48)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 사가미오오제키 소송은 객관 소송인 주민 소송으로 제기된 것이며, 자연의 권리론 등으로 원고 적격의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행정 사건 소송법상 항고 소송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아마미 자연의 권리 소송 판결에서도 문제 제기로서는 이해를 보인다는 취지가 판결 이유에서 언급되고 있다.[38]
2004년에는 오키나와의 헤노코에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사업에 관하여,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인간이 아닌 동물 종인 "듀공", 일본의 NGO인 "생물다양성센터", "터틀 아일랜드 회복 네트워크", "일본환경법률가연맹(JELF)", "듀공보호기금위원회", "듀공네트워크 오키나와", "헬리포트 건설 저지 협의회" 및 개인 3명, 그리고 그들의 의뢰를 받은 미국인 Marcello Mollo 변호사에 의해, 시민 소송 조항의 본고장인 미국의 국방부·럼즈펠드 국방장관에 대해, 듀공의 서식지를 포함한 오키나와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었다.[42] 이 소송은 2004년 8월 4일에 심리가 시작되어 2005년 3월 2일에 실체 심리에 들어갈 것이 결정되었고, 2008년 1월 24일에 원고 측 승소 판결[43]이 나왔다. 국방부는 그 후에도 "(환경 평가의 방법 선택은) 자체 재량권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시민 소송 조항을 가지지 않은 나라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최초의 자연의 권리에 근거한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 국내에서 원고 측이 '자연의 권리' 개념을 활용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던 초기 대표적인 소송은 다음과 같다.[45]
6. 한국 사회에의 적용과 과제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와 함께 문서 제목, 섹션 제목, 요약(있는 경우)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 형식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7. 관련 이니셔티브
2000년대 초반, 더욱 강력하고 활동적인 초국가적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옹호되던 원칙들이 법률로 더 많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시스템 변화 이니셔티브 및 인권 운동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발생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더 잘 반영하려는 새로운 경제 및 금융 모델의 개발 및 구현
- 토착민의 권리와 자연의 권리를 모두 진전시키기 위한 토착민의 리더십
- 물에 대한 인권과 같은 국제적 사회 운동
- 야생화와 같이 자연의 권리 틀과 일치하는 실용적인 해결책의 발전
-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 운동 허브 개발을 통해 자연의 권리 운동 역량 강화
자연의 권리 법률의 이행을 보여주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자연의 권리를 위한 세계 동맹'(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은 "국제 자연 권리 재판소"를 설립했다. 이들은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이며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발표한다. 재판소는 자연의 권리, 인권 및 토착민의 권리 옹호자들을 상설인민재판소와 유사한 절차에 모은다. 재판소의 목표는 기본적인 권리 침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현행법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자연 시스템에 공식적인 공개적 인정, 가시성 및 목소리를 제공하고 그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법학자 및 다른 학자들이 이러한 법률의 광범위한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분석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문 연구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초기 이행의 성공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8. 대중 문화 속 자연의 권리
자연의 권리 개념은 대중문화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2018년 다큐멘터리 영화 ''자연의 권리: 세계적인 운동''(Rights of Nature: A Global Movement)은 자연의 권리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구조를 만드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루었다.[12]
2020년에 공개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자연의 권리 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는 조슈아 보아즈 프리바닉(Joshua Boaz Pribanic)과 멜리사 트라우트먼(Melissa Troutman)이 감독을 맡았고, 배우 마크 러팔로(Mark Ruffalo)가 제작 총괄 및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 영화는 최고 다큐멘터리 상 4개를 수상했다.[13]
2019년 퓰리처상 소설 부문(Pulitzer Prize for Fiction)을 수상하고 1년 넘게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The New York Times Best Seller list)에 올랐던 ''오버스토리''(The Overstory)는 나무와의 관계와 나무의 권리를 다루었다.
팟캐스트 ''피해''(Damages)는 다양한 맥락에서 자연의 권리 개념을 다룬다.[14]
''데일리 쇼''(The Daily Show)는 한 에피소드에서 자연의 권리 개념을 다루었다.
참조
[1]
논문
Putting the rights of nature on the map. A quantitative analysis of rights of nature initiatives across the world
2022-06-13
[2]
논문
Science and the legal rights of nature
https://doi.org/10.1[...]
2023
[3]
논문
Mejorar los conflictos: derechos de la Amazonía en mundos cosmopolíticos
https://revistasojs.[...]
2024-01-31
[4]
논문
Removing the Veil from the 'Rights of Nature': The Dichotomy between First Nations Customary Rights and Environmental Legal Personhood
https://doi.org/10.1[...]
2024-02-22
[5]
논문
Rights of Nature, Legal Personality, and Indigenous Philosophies
https://www.cambridg[...]
2024-03-16
[6]
논문
Nature's rights as Indigenous rights? Mis/recognition through personhood for Te Urewera
https://journals.ope[...]
2024-03-19
[7]
논문
Producing juridical knowledge: "Rights of Nature" or the naturalization of rights?
https://doi.org/10.1[...]
2024-03-16
[8]
논문
Can Rights of Nature Save Us from the Anthropocene Catastrophe? Some Critical Reflections from the Field
https://www.cambridg[...]
2024-03-29
[9]
웹사이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Moon
https://www.earthlaw[...]
Australian Earth Laws Alliance
2021-05-10
[10]
논문
Moon, Inc.: The New Zealand Model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Natural Resources Applied to Space
https://www.liebertp[...]
2022-07-30
[11]
웹사이트
Hear Ye! Hear Ye! 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Moon
http://eos.org/featu[...]
2022-04-09
[12]
Youtube
The Rights of Nature: A Global Movement (film)
https://www.youtube.[...]
2022-08-02
[13]
웹사이트
Rights of Nature Film "INVISIBLE HAND" Wins Three Best Documentary Awards
https://www.invisibl[...]
2022-06-09
[14]
웹사이트
Damages on Apple Podcasts
https://podcasts.app[...]
2022-04-15
[15]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16]
서적
1997
[17]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18]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19]
서적
1993
[20]
웹사이트
アメリカ環境判例の流れ(関根孝道)
http://www.jelf-just[...]
[21]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22]
서적
A Sand County Almanac Illustrated
講談社学術文庫
[23]
문서
動物裁判
[24]
서적
1993
[25]
웹사이트
Wikipedia英語版の当該説明項目
:en:William O. Dougl[...]
[26]
웹사이트
http://supreme.justi[...]
[27]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28]
문서
シエラクラブ対モートン
[29]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30]
뉴스
ウサギが知事を訴えた~誰が原告になれるのか
NHK
1995-05-15
[31]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32]
문서
シエラクラブ対モートン
[33]
문서
岡本太郎美術館環境アセスメント訴訟
1998-03-18
[34]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35]
서적
動物に権利はあるか(原題:The Animal Rights Controversy)
NHK出版
[36]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37]
서적
1997
[38]
간행물
73 アマミノクロウサギ処分取消請求事件―自然の権利論と環境原告適格
[39]
서적
2006
[40]
간행물
74 オオヒシクイ事件―自然の権利訴訟と住民訴訟
[41]
판례
1999-01-22
[42]
법률문서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43]
법률문서
国防総省の環境アセスメント文書提出命令
[44]
서적
2006
[45]
서적
報告 日本における[自然の権利]運動
[46]
법률문서
奄美自然の権利訴訟
[47]
판례
1996-02-20
[48]
판례
1996-04-23
[49]
웹사이트
川崎市岡本太郎美術館 - 環境アセスメント条例違反参照
[50]
웹인용
박태현, 2019. 에콰도르 헌법상 자연의 권리, 그 이상과 현실, 환경법연구, vol.41, no.2, pp. 107-141 (35 pages)
https://www.kci.go.k[...]
2019
[51]
웹인용
Ecuador: 2008 Constitution in English
https://pdba.georget[...]
2022-10-2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