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 운송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평행 운송은 곡선을 따라 기하학적 대상을 이동시키면서 대상의 "방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에레스만 접속, 코쥘 접속, 주접속 등 다양한 종류의 접속을 통해 정의된다. 특히, 벡터 다발의 코쥘 접속을 통해 정의될 경우, 닫힌 곡선을 따라 평행 운송은 일반 선형군의 원소를 이루며, 이러한 폐곡선 평행 운송들이 구성하는 군을 홀로노미라고 한다. 평행 운송은 접속의 국소적인 실현이며, 접속을 알면 평행 운송을 계산할 수 있고, 반대로 평행 운송을 알면 접속을 복원할 수 있다. 리만 다양체에서 평행 운송은 레비-치비타 접속을 통해 정의되며, 이는 리만 계량을 보존한다. 평행 운송은 주다발과 같은 다른 유형의 연결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수 있으며, 카르탕 접속에서는 곡선을 따라 모델 공간을 "굴리는" 전개로 생각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미분기하학 - 가우스 곡률
가우스 곡률은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 놓인 곡면의 두 주곡률의 곱으로, 곡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곡면 자체의 길이 측정만으로 결정되는 내재적인 값이다. - 미분기하학 - 가우스의 빼어난 정리
가우스의 빼어난 정리는 곡면의 가우스 곡률이 외부 공간이 아닌 곡면 자체의 리만 계량만으로 결정된다는 정리로, 곡면의 변형 시 가우스 곡률이 보존됨을 의미하며, 지도 제작의 불가능성 증명과 고차원 리만 다양체 일반화에 응용되어 미분기하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된다.
| 평행 운송 | |
|---|---|
| 개요 | |
| 정의 | 미분기하학에서 접선벡터의 이동 방식 |
| 다른 이름 | 평행 수송 |
| 영어 명칭 | Parallel transport |
| 일본어 명칭 | 平行移動 (헤이코이도) |
| 상세 정보 | |
| 설명 | 곡면이나 미분다양체 위에서 벡터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벡터의 "방향"이 이동 경로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냄. |
| 특징 | 일반적으로 시작점과 도착점이 같은 폐곡선을 따라 벡터를 평행 이동시키면 원래 벡터와 다른 벡터가 됨. 이러한 차이는 곡률과 관련이 있음. |
| 관련 개념 | 공변 미분, 측지선, 접속 |
| 활용 |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의 곡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 |
2. 정의
평행 운송은 주어진 곡선을 따라 벡터 또는 다른 기하학적 대상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이동 과정에서 대상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행 운송은 에레스만 접속, 코쥘 접속, 주접속 등 다양한 종류의 접속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매끄러운 다양체 위의 매끄러운 벡터 다발 에 코쥘 접속 가 주어지면, 평행 운송은 두 실수 벡터 공간 사이의 실수 선형 변환을 이룬다. 리 군 에 대하여 가 -매끄러운 주다발이고, 에레스만 접속이 의 주접속인 경우에도 평행 운송을 정의할 수 있다.
의 각 점 에는 에서 에 접하는 벡터로 생각되는 접선 공간 이 존재한다.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평행 이동을 통해 모든 접선 공간이 서로 정규적으로 동일시되므로, 벡터를 한 접선 공간에서 다른 접선 공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일반적인 리만 다양체에서 접선 벡터의 평행 이동은 곡선을 따라 한 접선 공간에서 다른 접선 공간으로 벡터를 이동하는 방법이다.
2. 1. 에레스만 접속
다음이 주어졌다고 하자.그렇다면, 의 로의 '''올림'''은 다음 그림이 가환하게 되는 곡선
:
이다.
:
위에 에레스만 접속 가 주어졌다고 하자. 만약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에 대하여 '''수평 올림'''(horizontal lift영어)이라고 한다.
:
즉, 올림의 접벡터가 항상 수평이어야 한다 (수평 다발 에 속해야 한다).
주어진 에레스만 접속 및 초기 조건 에 대하여, 모든 곡선은 의 근방에서 유일한 수평 올림을 갖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곡선의 대역적 수평 올림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이는 함수
:
를 정의한다. 이를 의, 를 따른 '''평행 운송'''(parallel transport영어)이라고 한다.
2. 2. 코쥘 접속
코쥘 접속(Koszul connection)은 벡터 다발 위에서 정의되며, 공변 미분(covariant derivative)을 사용하여 평행 운송을 정의한다. 곡선을 따라 평행한 벡터장은 공변 미분이 0이 되는 벡터장이다.가 매끄러운 벡터 다발이고, 에레스만 접속이 의 코쥘 접속 로 주어지는 경우, 평행 운송은 다음과 같다.
:
이는 두 실수 벡터 공간 사이의 실수 선형 변환을 이룬다.
만약 가 폐곡선이면, 이는 일반 선형군의 원소를 이룬다.
:
이러한 폐곡선 평행 운송들이 구성하는 군을 '''홀로노미'''라고 한다.
'''M'''을 아핀 접속 가 있는 다양체라고 할 때, 임의의 벡터장 에 대해 이면 벡터장 는 '''평행'''하다고 한다. 이는 평행 벡터장이 "모든 미분이 0"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상수"임을 뜻한다. 평행 벡터장을 두 점 와 에서 평가하면, 에서의 접선 벡터와 에서의 접선 벡터 간의 식별이 얻어진다. 이러한 접선 벡터는 서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더 정확하게, 이 구간 로 매개변수화된 곡선이고, 이며, 여기서 인 경우, 벡터장 가 를 따라 (그리고 특히, 에서 이 벡터장의 값)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를 를 따라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 모든 에 대해
#
공식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가 당김 접속에 대해 평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김 번들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소 자명화에서 이것은 선형 미분 방정식의 일차 시스템이며, 두 번째 조건에 의해 주어진 임의의 초기 조건에 대해 유일한 해를 갖는다 (예를 들어, 피카르-린델뢰프 정리에 의해).
곡선 을 따라 의 접선 공간 으로의 평행 이동은 로 표시한다. 다음 사상
:
은 선형이며, 동형 사상이다. 을 역 곡선 라고 하면, 는 의 역이다.
요약하면, 평행 이동은 아핀 접속을 사용하여 곡선을 따라 접선 벡터를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유지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곡선의 두 끝점에서의 접선 공간 간의 선형 동형 사상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동형 사상은 일반적으로 곡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곡선을 따라 평행 이동을 사용하여 에서 평행 벡터장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의 곡률이 0인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선형 동형 사상은 정렬된 기저 또는 '''프레임'''에 대한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평행 이동은 곡선을 따라 (접선) 프레임 번들 의 요소를 이동하는 방법으로도 특징지을 수 있다. 즉, 아핀 접속은 의 임의의 곡선 를 의 곡선 로 '''올림'''을 제공한다.
''M''을 매끄러운 다양체라고 하고, ''E'' → ''M''을 접속 ∇를 갖는 벡터 다발이라고 할 때, ''γ'': ''I'' → ''M''을 열린 구간 ''I''로 매개변수화된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하자. ''γ''를 따라가는 의 단면 는 다음과 같은 경우 '''평행'''이라고 한다.
:
가 가 접선 벡터장인 접선 다발인 경우, 이 표현은 구간의 모든 에 대해, 접선 벡터 방향으로 에서 무한소 변위를 수행할 때 의 접선 벡터가 "상수" (도함수가 사라짐)임을 의미한다.
단면 대신 ''P'' = ''γ''(0) ∈ ''M''에서 요소 ''e''0 ∈ ''E''''P''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γ''를 따라가는 ''e''0의 '''평행 이동'''은 ''e''0을 ''γ''에서 평행한 ''단면'' ''X''로 확장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X''는 ''γ''를 따라가는 ''E''의 고유한 부분으로,
#
#
임의의 좌표 패치에서 (1)은 상미분 방정식을 정의하며, 초기 조건은 (2)에서 주어진다. 따라서 피카르-린델뢰프 정리는 해의 존재와 유일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접속 ∇는 곡선을 따라 섬유의 요소를 이동하는 방법을 정의하며, 이는 곡선을 따라 점에서의 섬유 간의 선형 동형 사상을 제공한다.
:
γ(''s'') 위에 있는 벡터 공간에서 γ(''t'') 위에 있는 벡터 공간으로의 사상이다. 이 동형 사상은 곡선과 관련된 '''평행 이동'''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섬유 간의 동형 사상은 일반적으로 곡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곡선을 따라 평행 이동을 사용하여 모든 ''M''에 걸쳐 ''E''의 평행 단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의 '''곡률'''이 0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점 ''x''에서 시작하는 닫힌 곡선을 따라 평행 이동은 접선 공간의 자기 동형 사상을 정의하며, 이는 반드시 자명한 것은 아니다. ''x''에서 모든 닫힌 곡선에 의해 정의된 평행 이동 자기 동형 사상은 ∇의 ''x''에서의 홀로노미 군이라고 하는 변환군을 형성한다. 이 그룹과 ∇의 ''x''에서의 곡률 값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Ambrose–Singer 홀로노미 정리의 내용이다.
''M''은 매끄러운 다양체, ''E'' → ''M''은 벡터 다발이며, 이 벡터 다발 ''E''는 공변 미분 ∇을 갖는다.
또한, ''γ'': ''I'' → ''M''는, 열린 구간 ''I''에 의해 매개변수화된 매끄러운 곡선이다.
가 벡터 다발 ''E''의, 곡선 ''γ''를 따른 단면이라고 하면, 가 다음을 만족하면 "는 곡선 ''γ''를 따라 평행"이라고 한다.
:
점 ''P'' = ''γ''(0) ∈ ''M''에서, 벡터 ''e''0 ∈ ''E''''P''가 주어졌다고 하면, ''e''0의 ''γ''를 따른 평행 이동"은, ''e''0를, 곡선 ''γ''를 따라 평행한 단면 ''X''에 의해 연장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점 ''P'' = ''γ''(0) ∈ ''M''에서, 벡터 ''e''0 ∈ ''E''''P''가 주어졌을 때, 다음을 충족하는 "곡선 ''γ''를 따른 단면" ''X''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 (1).
- (2) .
실제로, 임의의 국소 좌표계에서, 위의 (1)은 상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 있으며, (2)는, 그 초깃값이다. 따라서, 피카르-린델뢰프 정리(상미분 방정식의 해의 존재와 유일성의 정리)에 의해, 해의 존재와 유일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접속 ∇가 정해지면, 올의 요소(즉, 벡터)를 곡선을 따라 이동시키는 방법이 정해지고, 이것은 곡선 위의 임의의 점 위의 올 사이에 선형 동형을 정한다.
:
즉, 임의의 에 대해 (점 γ(''s'') 위의 올)와, (점 γ(''t'') 위의 올)는 모두 선형 공간이지만,
는, 와 사이의 선형 동형이다.
이 선형 동형을, "곡선 γ를 따르는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 얻어진 올 사이의 선형 동형은, 일반적으로, 곡선의 선택에 의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의 곡선을 따른 평행 이동을 사용하여, ''M''의 모든 점 위에 ''E''의 평행 단면을 정의할 수 있게 되므로, ∇의 곡률은 0이 아니어야 한다.
M 위의 ''x''를 기점으로 하는 닫힌 곡선에 의한 평행 이동을 사용하면, 확실히 ''x''의 접벡터 공간에 자기 동형을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자명한 선형 동형일 필요는 없음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x''를 기점으로 하는 닫힌 곡선을 따른 평행 이동에 의해 정해지는 자기 동형"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의 홀로노미 군이라고 불리는 변환군을 형성한다. 이 군과, ∇의 곡률 값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Ambrose–Singer 정리의 일부이다.
공변 미분 ∇가 주어지면, 임의의 매끄러운 곡선 γ에 대해 " γ를 따라 평행"이라는 개념이 에 의해 정해지고, "γ를 따른 평행 이동"도 정해진다. 그러면 반대로, 적절한 평행 이동이 정해진 경우에, 평행 이동으로부터 접속을 정할 수 있다.
다양체 위의 임의의 곡선 γ 각각에 대해,
:
가 정해지고, 다음을 충족한다.
# , 이것은 ''E''γ(s)의 항등 변환이다.
#
# 는 ''s''와 ''t''에 대해 매끄럽고, γ에 대해서도 매끄럽다.
위 3에서 "매끄러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다.
고바야시나 노미즈 등 현대적인 저술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매끄러움"이 더 쉽게 표현되는 다른 의미의 접속으로부터 온다고 보며, 접속의 평행 이동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행 이동에서 이러한 규칙을 생각하면, ''E''에서의 접속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γ는 ''M'' 위의 미분 가능한 곡선이며, 그 초기값은 γ(0)이고, 접벡터의 초기 조건은 ''X'' = γ′(0)이라고 한다. ''V''는 벡터 다발 ''E''의, 곡선 ''γ''를 따른 절단이라고 할 때,
:
는, 관련된 infinitesimal connection ∇를, ''E'' 위에 정한다. 이 infinitesimal connection으로부터, 같은 평행 이동 Γ를 복원할 수 있다.
2. 3. 주접속
리 군 에 대하여 가 -매끄러운 주다발이며, 에레스만 접속이 의 주접속이라고 하자. 이 경우, 평행 운송:
을 정의할 수 있다. 만약 가 폐곡선이라면,
:
는 어떤 군 원소 의 오른쪽 군 작용에 의하여 주어진다.
:
즉, 이 경우 평행 운송은 의 원소로 주어진다.
평행 운송은 벡터 다발에서 정의된 연결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연결에 대해서도 더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 가지 일반화는 주다발에 대한 것이다. 구조 리 군 ''G''와 주 연결 ω를 갖는 다양체 ''M'' 위의 주다발 ''P'' → ''M''을 고려하자. 벡터 다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에 대한 주 연결 ω는 ''M''의 각 곡선 γ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매핑을 정의한다.
:
γ(''s'') 위의 올에서 γ(''t'') 위의 올로의 매핑이며, 이는 동질 공간의 동형 사상이다. 즉, 각 ''g''∈''G''에 대해 이다.
3. 평행 운송과 접속
공변 미분 ∇가 주어졌을 때, 곡선 γ를 따라 평행 운송은 조건 을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적절한 평행 운송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미분을 통해 해당하는 접속을 얻을 수 있다. 이 접근 방식은 본질적으로 크네벨만에 기인하며, 구겐하이머 및 루미스테의 방식을 따른다.
다양체 내의 각 곡선 γ에 다음과 같은 사상들의 모임을 할당한다.
: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 , 즉 ''E''γ(s)의 항등 변환.
#
# Γ의 γ, ''s'', ''t''에 대한 의존성은 "매끄럽다."
조건 3에서의 매끄러움의 개념은 다소 규정하기 어렵다(섬유 다발에서의 평행 운송에 대한 아래 논의를 참조). 특히, 고바야시와 노미즈와 같은 현대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접속의 평행 운송을, 매끄러움이 더 쉽게 표현되는 다른 의미에서의 접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행 운송에 대한 이러한 규칙이 주어지면, 다음과 같이 ''E''에서 관련된 미소 접속을 복원할 수 있다. ''M''에서 시작점 γ(0)과 초기 접선 벡터 ''X'' = γ′(0)을 갖는 미분 가능한 곡선 γ를 고려하자. ''V''가 γ에 대한 ''E''의 단면이면, 다음을 정의한다.
:
이는 ''E''에서 관련된 미소 접속 ∇을 정의한다. 이 미소 접속으로부터 동일한 평행 운송 Γ을 복원할 수 있다.
다양체가 아핀 접속을 갖는 경우 (혹은 접속 다발 위에 공변 미분 또는 접속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 접속을 사용하면 접속에 대한 평행성을 유지하면서 곡선을 따라 다양체에 "생긴" 벡터를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이 정하는 평행 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곡선을 따라 다양체의 국소적인 기하학을 이동하는 방법", 즉, 근처 점들끼리의 기하학을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의미를 갖는 "평행 이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특징—즉, 곡선상의 점들의 기하학을 연결하는 것—은 접속을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실제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접속 개념은 평행 이동의 무한소 근사이다. 또한 역으로, 평행 이동을 정하는 것은 접속의 국소적인 실현이다.
평행 이동은 접속의 국소적인 실현을 제공하므로, 홀로노미로 알려진 곡률의 국소적인 실현도 제공한다. Ambrose–Singer 정리는 곡률과 홀로노미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접속의 다른 특징으로는 고유한 평행 이동 시스템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벡터 다발의 Koszul 접속에서는 공변 미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평행 이동을 정할 수 있다. 에레스만 접속이나 카르탕 접속은 다양체에서 주다발의 전 공간에 대한 "곡선의 올림"을 정한다. 이러한 "곡선의 올림"은 기준틀의 평행 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M''은 매끄러운 다양체, ''E'' → ''M''은 벡터 다발이며, 이 벡터 다발 ''E''는 공변 미분 ∇을 갖는다. 또한, ''γ'': ''I'' → ''M''는, 열린 구간 ''I''에 의해 매개변수화된 매끄러운 곡선이다.
가 벡터 다발 ''E''의, 곡선 ''γ''를 따른 단면이라고 하자. 이때, 가, 다음을 만족하면 "는 곡선 ''γ''를 따라 평행"이라고 한다.
:
점 ''P'' = ''γ''(0) ∈ ''M''에서, 벡터 ''e''0 ∈ ''E''''P''가 주어졌다고 하자. 대략적으로 말하면, "''e''0의 ''γ''를 따른 평행 이동"은, ''e''0를, 곡선 ''γ''를 따라 평행한 단면 ''X''에 의해 연장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점 ''P'' = ''γ''(0) ∈ ''M''에서, 벡터 ''e''0 ∈ ''E''''P''가 주어졌을 때, 다음을 충족하는 "곡선 ''γ''를 따른 단면", ''X''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 (1).
- (2).
실제로, 임의의 국소 좌표계에서, 위의 (1)은 상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 있으며, (2)는, 그 초깃값이다. 따라서, 피카르-린델뢰프 정리(상미분 방정식의 해의 존재와 유일성의 정리)에 의해, 해의 존재와 유일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접속 ∇가 정해지면, 올의 요소(즉, 벡터)를 곡선을 따라 이동시키는 방법이 정해지고, 이것은 곡선 위의 임의의 점 위의 올 사이에 선형 동형을 정한다.
:
즉, 임의의 에 대해 (점 γ(''s'') 위의 올)와, (점 γ(''t'') 위의 올)는 모두 선형 공간이지만, 는, 와 사이의 선형 동형이다.
이 선형 동형을, "곡선 γ를 따르는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이 방법으로 얻어진 올 사이의 선형 동형은, 일반적으로, 곡선의 선택에 의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의 곡선을 따른 평행 이동을 사용하여, ''M''의 모든 점 위에 ''E''의 평행 단면을 정의할 수 있게 되므로, ∇의 곡률은 0이 아니어야 한다.
M 위의 ''x''를 기점으로 하는 닫힌 곡선에 의한 평행 이동을 사용하면, 확실히 ''x''의 접벡터 공간에 자기 동형을 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자명한 선형 동형일 필요는 없음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x''를 기점으로 하는 닫힌 곡선을 따른 평행 이동에 의해 정해지는 자기 동형"으로 이루어진 집합은, ∇의 홀로노미 군을 형성한다. 이 군과, ∇의 곡률 값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Ambrose–Singer 정리의 일부이다.
공변 미분 ∇가 주어지면, 임의의 매끄러운 곡선 γ에 대해 " γ를 따라 평행"이라는 개념이 에 의해 정해지고, "γ를 따른 평행 이동"도 정해진다. 그러면 반대로, 적절한 평행 이동이 정해진 경우에, 평행 이동으로부터 접속을 정할 수 있을까? 이 접근법은 본질적으로 크네벨만에 준거한다; 구겐하이머 및 루미스테도 참조.
다양체 위의 임의의 곡선 γ 각각에 대해,
:
가 정해지고, 다음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 이것은 ''E''γ(s)의 항등 변환이다.
#
# 는 ''s''와 ''t''에 대해 매끄럽고, γ에 대해서도 매끄럽다.
위 3에서 "매끄러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다. 고바야시나 노미즈 등 현대적인 저술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매끄러움"이 더 쉽게 표현되는 다른 의미의 접속으로부터 온다고 보며, 접속의 평행 이동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행 이동에서 이러한 규칙을 생각하면, ''E''에서의 접속을 다음과 같이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γ는 ''M'' 위의 미분 가능한 곡선이며, 그 초기값은 γ(0)이고, 접벡터의 초기 조건은 ''X'' = γ′(0)이라고 한다. ''V''는 벡터 다발 ''E''의, 곡선 ''γ''를 따른 절단이라고 할 때,
:
는, 관련된 infinitesimal connection영어 ∇를, ''E'' 위에 정한다. 우리는, 이 infinitesimal connection영어으로부터, 같은 평행 이동 Γ를 복원할 수 있다.
4.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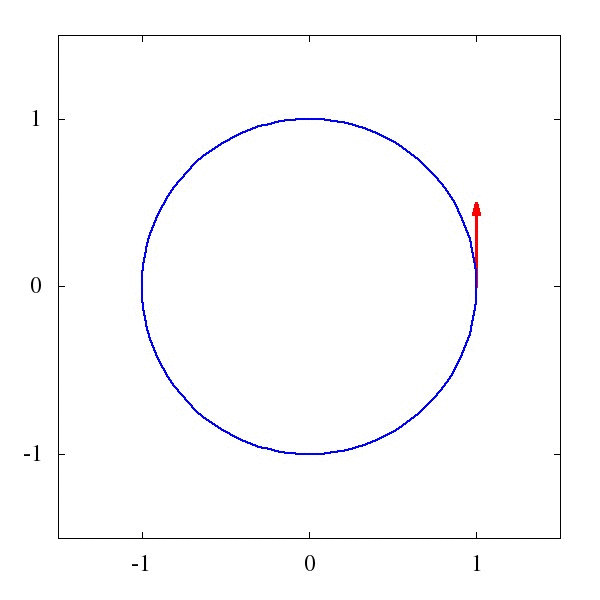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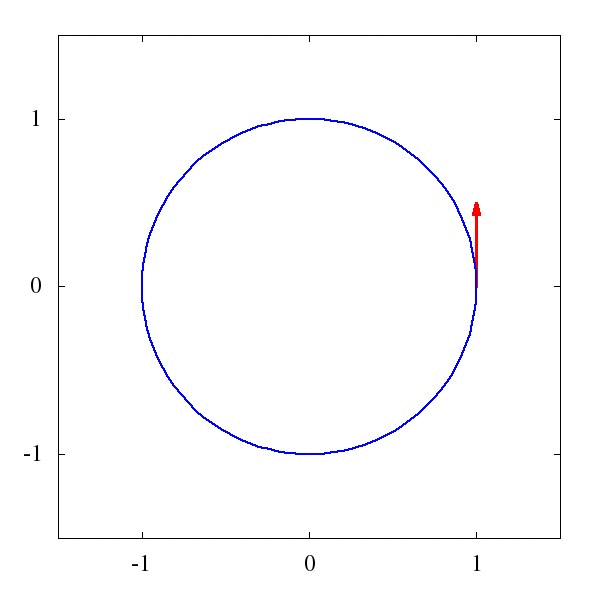
구멍뚫린 평면 에서 단위 원을 따라 평행 운송을 나타내는 두 가지 예시가 있다. 왼쪽 그림은 표준 유클리드 계량 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계량에 대한 것이다. 오른쪽 계량은 원점에서 특이점을 가지므로 구멍을 넘어 확장되지 않지만, 첫 번째 계량은 전체 평면으로 확장된다.
첫 번째 계량은 곡률이 0이므로, 원을 따라 두 점 사이를 이동할 때 다른 곡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계량은 0이 아닌 곡률을 가지며, 원은 측지선이므로 접선 벡터는 평행하다.
4. 1. 벡터 다발
매끄러운 벡터 다발 에 코쥘 접속 (에레스만 접속의 일종)이 주어지면, 평행 운송:
는 두 실수 벡터 공간 사이의 실수 선형 변환을 이룬다.
만약 가 폐곡선이면, 평행 운송은 일반 선형군의 원소가 된다.
:
이러한 폐곡선 평행 운송들이 구성하는 군을 '''홀로노미'''라고 한다.
벡터 다발 에서, 접속 ∇는 곡선을 따라 섬유의 요소를 이동하는 방법을 정의하며, 이는 곡선을 따라 점에서의 섬유 간의 선형 동형 사상을 제공한다.
:
이때, γ(''s'') 위에 있는 벡터 공간에서 γ(''t'') 위에 있는 벡터 공간으로의 사상이다. 이 동형 사상은 곡선과 관련된 '''평행 이동'''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섬유 간의 동형 사상은 일반적으로 곡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곡선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모든 곡선을 따라 평행 이동을 사용하여 모든 ''M''에 걸쳐 ''E''의 평행 단면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의 곡률이 0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점 ''x''에서 시작하는 닫힌 곡선을 따라 평행 이동은 접선 공간의 자기 동형 사상을 정의하며, 이는 반드시 자명한 것은 아니다. ''x''에서 모든 닫힌 곡선에 의해 정의된 평행 이동 자기 동형 사상은 ∇의 ''x''에서의 홀로노미 군이라고 하는 변환군을 형성한다. 이 군과 ∇의 ''x''에서의 곡률 값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Ambrose–Singer 홀로노미 정리의 내용이다.
4. 2. 리만 다양체
리만 다양체 에서 평행 운송은 레비-치비타 접속으로 정의되며, 이는 리만 계량 를 보존한다.[1] 리만 계량은 각 점 의 접선 공간 에 양의 정부호 내적 를 할당한다.계량 접속은 리만 계량을 보존하는 평행 운송을 갖는 접속으로, 임의의 곡선 와 벡터 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
''t'' = 0에서 미분하면, 연산자 ∇는 다음의 곱 규칙을 만족한다.
:
아핀 접속은 측지선을 정의하며, 리만 다양체의 측지선은 국소적으로 거리를 최소화하는 곡선이다. 의 노름(norm)이 일정하면, 곡선 ''γ'' 위의 두 점 ''γ''(''t''1)과 ''γ''(''t''2) 사이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 (단, ''A''는 의 노름)
이 공식은 측지선이 다양체를 감싸는 경우 등에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 3. 쉴드의 사다리
쉴드의 사다리는 평행 운송을 이산적으로 근사하는 방법으로, 곡선을 따라 유한한 단계를 거치고, 레비-치비타 평행사변형을 근사 평행사변형으로 근사한다.5. 홀로노미
holonomy영어는 폐곡선을 따라 평행 운송을 할 때 나타나는 기하학적 현상으로, 곡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홀로노미 군은 주어진 점에서 시작하는 모든 폐곡선에 대한 평행 운송으로 얻어지는 변환들의 집합이다.
리 군 에 대하여 가 -매끄러운 주다발이며, 에레스만 접속이 의 주접속인 경우, 폐곡선 에 대한 평행 이동은 다음과 같다.
:
이는 어떤 군 원소 의 오른쪽 군 작용에 의하여 주어지는데,
:
와 같이 표현된다. 즉, 이 경우 평행 운송은 의 원소로 주어진다.
특히, 점 ''x''에서 시작하는 닫힌 곡선을 따라 평행 이동을 하면 접선 공간의 자기 동형 사상이 정의되는데, 이는 반드시 자명한 것은 아니다. ''x''에서 모든 닫힌 곡선에 의해 정의된 평행 이동 자기 동형 사상은 ∇의 ''x''에서의 홀로노미 군이라고 하는 변환군을 형성한다. 이 군과 ∇의 ''x''에서의 곡률 값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Ambrose–Singer 홀로노미 정리의 내용이다.
평행 이동은 접속의 국소적인 실현을 제공하므로, 곡률의 국소적인 실현도 제공한다. Ambrose–Singer 정리는 곡률과 홀로노미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6. 일반화
평행 운송은 벡터 다발뿐만 아니라 주다발, 에레스만 접속, 카르탕 접속 등 다양한 기하학적 구조에서 정의될 수 있다.
리 군 에 대하여 가 -매끄러운 주다발이며, 에레스만 접속이 의 주접속이라고 하자. 이 경우, 평행 운송
:
을 정의할 수 있다.
만약 가 폐곡선이라면,
:
는 어떤 군 원소 의 오른쪽 군 작용에 의하여 주어진다.
:
즉, 이 경우 평행 운송은 의 원소로 주어진다.
다양체가 아핀 접속을 갖는 경우 (혹은 접속 다발 위에 공변 미분 또는 접속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 접속을 사용하면 접속에 대한 평행성을 유지하면서 곡선을 따라 다양체에 "생긴" 벡터를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접속이 정하는 평행 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곡선을 따라 다양체의 국소적인 기하학을 이동하는 방법", 즉, 근처 점들끼리의 기하학을 연결(connect)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접속 개념은 평행 이동의 무한소 근사이다. 또한 역으로, 평행 이동을 정하는 것은 접속의 국소적인 실현이다. 평행 이동은 접속의 국소적인 실현을 제공하므로, 홀로노미로 알려진 곡률의 국소적인 실현도 제공한다. Ambrose–Singer 정리는 곡률과 홀로노미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접속의 다른 특징으로는 고유한 평행 이동 시스템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벡터 다발의 Koszul 접속에서는 공변 미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평행 이동을 정할 수 있다.
6. 1. 전개 (미분 기하학)
주다발에 대한 평행 운송의 일반화가 가능하다. 구조 리 군 ''G''와 주 연결 ω를 갖는 다양체 ''M'' 위의 주다발 ''P'' → ''M''을 생각하자. 벡터 다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에 대한 주 연결 ω는 ''M''의 각 곡선 γ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매핑을 정의한다.:
이것은 γ(''s'') 위의 올에서 γ(''t'') 위의 올로의 매핑이며, 이는 동질 공간의 동형 사상이다. 즉, 각 ''g''∈''G''에 대해 이다.
평행 운송은 추가적으로 더 일반화할 수 있다. Ehresmann 연결의 맥락에서, 연결이 접공간의 특별한 개념인 "수평 올림"에 의존하는 경우, 수평 올림을 통해 평행 운송을 정의할 수 있다. Cartan 연결은 추가적인 구조를 가진 Ehresmann 연결로, 이를 통해 평행 운송을 다양체 내의 곡선을 따라 특정 모델 공간을 "굴리는" 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굴림을 전개라고 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