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문 철자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언문 철자법은 1928년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정된 조선어 철자법으로, 아동의 학습 능률 향상과 조선어 철자법의 통일을 목표로 했다. 1, 2차 조사회를 거쳐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도입했지만, 표음주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형태로 남았다. 이 철자법은 자모, 한자음, 받침, 합성어, 어미 표기법 등에서 현행 맞춤법과 차이를 보이며, 일본어 표기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언문 철자법은 이후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남북의 정서법에 영향을 미쳤다.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 제정 이후, 조선총독부는 1930년 '언문 철자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제정 과정은 2단계의 조사회를 거쳤다. 이 맞춤법은 주시경 문하의 형태주의파 학자들의 영향으로 형태주의적 표기법이 도입되었으나, 표음주의파의 반발로 인해 불완전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후 형태주의파 학자들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를 통해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고, 이는 해방 이후 남북한 맞춤법의 기초가 되었다.[1]
언문 철자법은 총설과 각설로 이루어지며, 총설은 3항, 각설은 25항이다. 또 부기 2항이 있다. 그리고 언문 철자법 본문과 별도로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분별서방)이 3항 있다.[1]
1930년에 발표된 언문 철자법은 현대 한글 맞춤법 및 조선말규범집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
2. 제정 경위
2. 1. 1차 조사회 (1928년)
1912년에 ‘보통학교’가 만들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아동의 학습 능률 향상, 조선어 철자법의 정리·통일을 위해 1928년부터 제1차 조사회를 거쳐 학무국 원안을 작성하였다. 제1차 조사회 조사 위원은 박승두, 박영빈, 심의린, 이세정이었다.[1]
2. 2. 2차 조사회 (1929년)
1929년부터 제2차 조사회에서 원안을 심의했다. 2차 조사 위원은 권덕규, 김상회, 신명균, 심의린, 이세정, 이완응, 장지영, 정열모, 최현배, 오구라 신페이, 다카하시 토루, 다나카 도쿠타로, 니시무라 신타로, 후지나미 요시사다였다.[1]
이 맞춤법은 이전의 조선총독부 맞춤법과 비교해 형태주의적 표기법을 널리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시경 문하의 권덕규, 신명균, 심의린, 정열모, 최현배 등 형태주의파 학자들이 조사 위원으로 많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 다만, 형태주의에 대한 표음주의파의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언문 철자법에 나타난 불완전한 형태주의는 두 파의 갈등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1]
3. 구성
4. 특징
한자음 표기법에서는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년)에서 유지되었던 낡은 표기법을 버리고 실제 발음대로 적는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댱관'은 '장관'으로, '뎍당'은 '적당'으로 표기하는 식이다.[1]
받침 표기법에서는 형태주의를 도입하여 어간을 일정하게 적도록 했다. 'ㄷ, ㅌ, ㅈ, ㅊ, ㅍ'과 같은 자음과 'ㄲ, ㄳ, ㅄ, ㄵ, ㄾ, ㄿ, ㄺ, ㄻ, ㄼ'과 같은 두 글자 받침도 허용했다. 예를 들어 '밧헤'는 '밭에'로, '갑슨'은 '값은'으로 적었다.[1]
하지만, 'ㅋ, ㅎ' 받침은 인정하지 않았고, 'ㄶ, ㅀ, ㅆ' 받침도 허용되지 않았다. '조타', '만타'는 각각 '좋다', '많다'로 쓰는 현대 맞춤법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받침 'ㅊ'으로 끝나는 체언에 조사 '에'가 붙을 때는 '테'로, 'ㅌ'으로 끝나는 체언에 '이'가 붙을 때는 '치'로 적는 등 불완전한 형태주의를 보여주기도 했다.[1]
: * '현행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남)과 조선말규범집(북)을 말한다.
ㄷ불규칙 용언의 받침에는 'ㅅ'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뭇다(問)'는 '묻다'로, '듯다'는 '듣다'로 표기했다.
합성어 표기법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동일하게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표기했지만, 첫째 요소가 자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한 글자로 적었다. 예를 들어 '문ㅅ자'는 '문자'로 표기했다.
어미 표기법에서는 용언 '-아/-어'형에서 어간 끝소리가 'ㅣ, ㅐ, ㅔ, ㅚ, ㅟ, ㅢ'일 경우에 '-여'를 붙였다.
/요/ 로 발음되는 어미는 하오체와 해요체에 연유되는 것을 가리지 않고 둘다 '오'로 적었다. 부사형 어미 '-이, -히'는 발음에 따라 가려 쓴다고 하였다.
4. 1. 자모
자모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없다. 다만, 자음 자모의 명칭에 대해서는 부기 1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ㄱ|기역한국어, ㄴ|니은한국어, ㄷ|디귿한국어, ㄹ|리을한국어, ㅁ|미음한국어, ㅂ|비읍한국어, ㅅ|시옷한국어
: ㅇ|이응한국어, ㅈ|지읒한국어, ㅊ|치읓한국어, ㅋ|키윽한국어, ㅌ|티읕한국어, ㅍ|피읖한국어, ㅎ|히읗한국어
이 명칭은 훈몽자회(1527년)에서의 명칭을 답습한 것이며, 현재 한국에서의 명칭도 대체로 답습하고 있지만[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4. 2. 한자음 표기법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년)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표기 원칙이 달랐다. 고유어는 실제 발음대로 적었지만, 한자어는 실제 발음과 동떨어진 옛 표기법을 유지했다. 그 결과, 모음 글자 'ㆍ'(아래아)나 /저/로 발음되는 '뎌', '져'와 같은 낡은 철자가 한자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언문 철자법에서는 이러한 한자어 표기의 잔재를 없애고, 고유어와 마찬가지로 실제 발음에 따라 적기로 하였다.
4. 3. 받침 표기법
그 이전의 맞춤법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향이 강했고, 받침 글자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일곱 가지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았다. 언문 철자법에서는 형태주의를 도입하여 어간을 일정하게 적도록 했다. 형태주의적 표기법 도입과 함께 'ㄷ, ㅌ, ㅈ, ㅊ, ㅍ'과 같은 자음과 'ㄲ, ㄳ, ㅄ, ㄵ, ㄾ, ㄿ, ㄺ, ㄻ, ㄼ'과 같은 두 글자 받침도 인정했다.
반면 'ㅋ, ㅎ'을 받침 글자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쓰이는 두 글자 받침 중 'ㄶ, ㅀ, ㅆ'은 허용되지 않았다.
: * '현행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남)과 조선말규범집(북)을 말한다.
받침 'ㅊ'으로 끝나는 체언에 조사 '에'가 붙을 때는 '테'로 적었다. 또 'ㅌ'으로 끝나는 체언에 '이'가 붙을 때는 '치'로 적었다. 이는 실제 발음에 따른 표기법이지만, 언문 철자법의 불완전한 형태주의를 보여준다.
ㄷ불규칙 용언의 받침에는 'ㅅ'를 사용했다.
4. 4. 합성어 표기법
한글 맞춤법(한국 현행 맞춤법)과 동일하게 합성어에서 첫째 요소 끝에 사이시옷을 받침으로 표기한다. 하지만 한글 맞춤법에서는 첫째 요소가 자음으로 끝날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지만, 언문 철자법에서는 첫째 요소가 자음으로 끝날 경우 첫째 요소와 둘째 요소 사이에 사이시옷을 한 글자로 적었다.
참고로, 요소 사이에 사이시옷을 한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은 1933년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1940년 개정판에서 채택되었다.
4. 5. 어미 표기법
용언 '-아/-어'형에서 어간 끝소리가 'ㅣ, ㅐ, ㅔ, ㅚ, ㅟ, ㅢ'일 경우에 '-여'를 붙인다. 끝소리가 'ㅣ'인 경우는 뒤에 오는 '-여'와 함께 줄여서 'ㅕ'로 적으며 '이여'로 적는 것은 ㅅ불규칙 용언에 한정된다. 또 '지, 치'에 '-여'가 붙어서 줄어질 때는 '저, 처'로 적었는데 이는 '져, 쳐'라는 적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이 표기에 관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완전한 형태주의에 의거해 양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아', 음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어'로 적기로 했으며 현행 한글 맞춤법도 이를 따른다. 한편 북한에서는 조선어 철자법(1954년)에서 이미 언문 철자법과 마찬가지로 '-여'로 적기로 되어 있다.[1]
/요/ 로 발음되는 어미는 하오체에 연유되는 것과 해요체에 연유되는 것을 가리지 않고 둘다 '오'로 적었다.[1]
부사형 어미 '-이, -히'는 발음에 따라 가려 쓴다고 하며 현행 맞춤법과 구분할 원리를 달리한다.[1]
5. 일본어 표기 규정
‘ス일본어, ツ일본어’를 ‘스, 쓰’로 표기하는 점은 한국의 현행 일본어 표기법과 궤를 같이한다. 그 한편 장모음 표기에 일본어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장음 기호 ‘ー일본어’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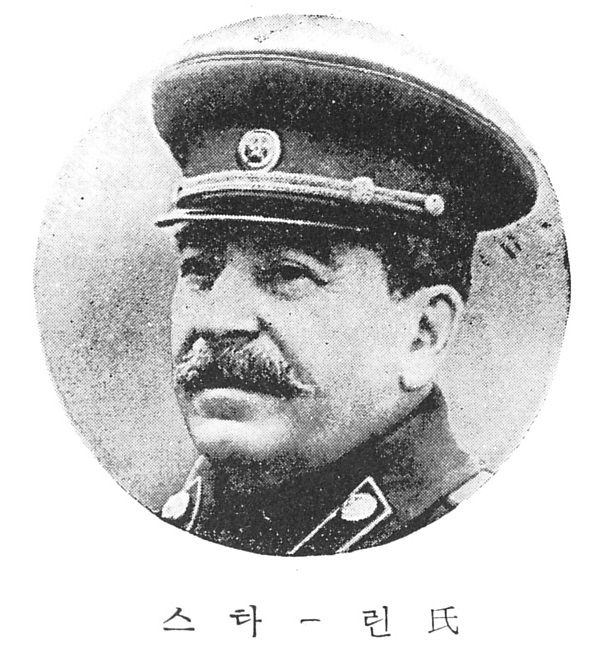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