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6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미국 수정 헌법 제6조는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공정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범죄 발생 지역에서 재판받을 권리, 혐의 내용을 통보받을 권리, 증인 대질권, 증인 소환 요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각 권리의 적용 범위와 제한이 해석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791년 12월 -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대배심 고발, 이중 처벌 금지, 자기 부죄 거부권, 적법 절차에 따른 법 집행, 정당한 보상 없는 사유 재산 수용 금지 등을 규정한다. - 1791년 12월 - 미국 수정 헌법 제2조
미국 수정 헌법 제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총기 규제 논쟁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 1791년 미국 - 권리장전 (미국)
미국 권리장전은 강력한 중앙 정부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자유 보장 요구를 반영하여 미국 헌법에 추가된 첫 열 개의 수정 조항으로, 종교, 언론, 집회, 무기 소지 등의 자유와 적법 절차, 이중처벌 금지, 자기부죄 거부권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1791년 미국 -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미국 수정 헌법 제5조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대배심 고발, 이중 처벌 금지, 자기 부죄 거부권, 적법 절차에 따른 법 집행, 정당한 보상 없는 사유 재산 수용 금지 등을 규정한다. - 1791년 법 - 1791년 프랑스 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제정된 프랑스 최초의 입헌 헌법으로, 왕권신수설을 폐기하고 입헌군주제를 수립했으나 제한된 선거권으로 사회적 불만을 야기했고 튈르리 궁전 습격으로 무력화되어 역사적 의미를 잃었다. - 1791년 법 - 권리장전 (미국)
미국 권리장전은 강력한 중앙 정부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자유 보장 요구를 반영하여 미국 헌법에 추가된 첫 열 개의 수정 조항으로, 종교, 언론, 집회, 무기 소지 등의 자유와 적법 절차, 이중처벌 금지, 자기부죄 거부권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미국 수정 헌법 제6조 | |
|---|---|
| 미국 수정 헌법 제6조 | |
| 정식 명칭 |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6조 |
| 발효일 | 1791년 12월 15일 |
| 제안일 | 1789년 9월 25일 |
| 비준일 | 1791년 12월 15일 |
| 내용 | |
| 주요 내용 | 형사 피고인의 권리 보장 |
| 보장된 권리 |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면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구체적 권리 |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이유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증인을 불러내도록 정부에 강요할 권리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관련 조항 | |
| 수정 헌법 제5조 | 미국 수정 헌법 제5조 (자기부죄 금지, 적법절차) |
| 수정 헌법 제14조 |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적법절차, 평등 보호) |
| 역사적 배경 | |
| 권리 장전의 일부 | 미국 권리 장전에 포함됨 |
| 제정 이유 | 식민지 시대의 불공정한 형사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
| 적용 및 해석 | |
| 적용 범위 | 연방 및 주 정부의 형사 재판에 적용 |
| 중요 판례 | 기디언 대 웨인라이트 사건 (1963), 미란다 대 애리조나 사건 (1966) |
| 변호인 조력권 | 빈곤한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을 제공해야 함 |
| 배심원 재판 | 심각한 범죄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 기타 | |
| 관련 법률 | 1966년 형사소송법 |
| 언어 | 영어 |
2. 전문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특별구는 법에 의하여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미국 수정 헌법 제6조는 형사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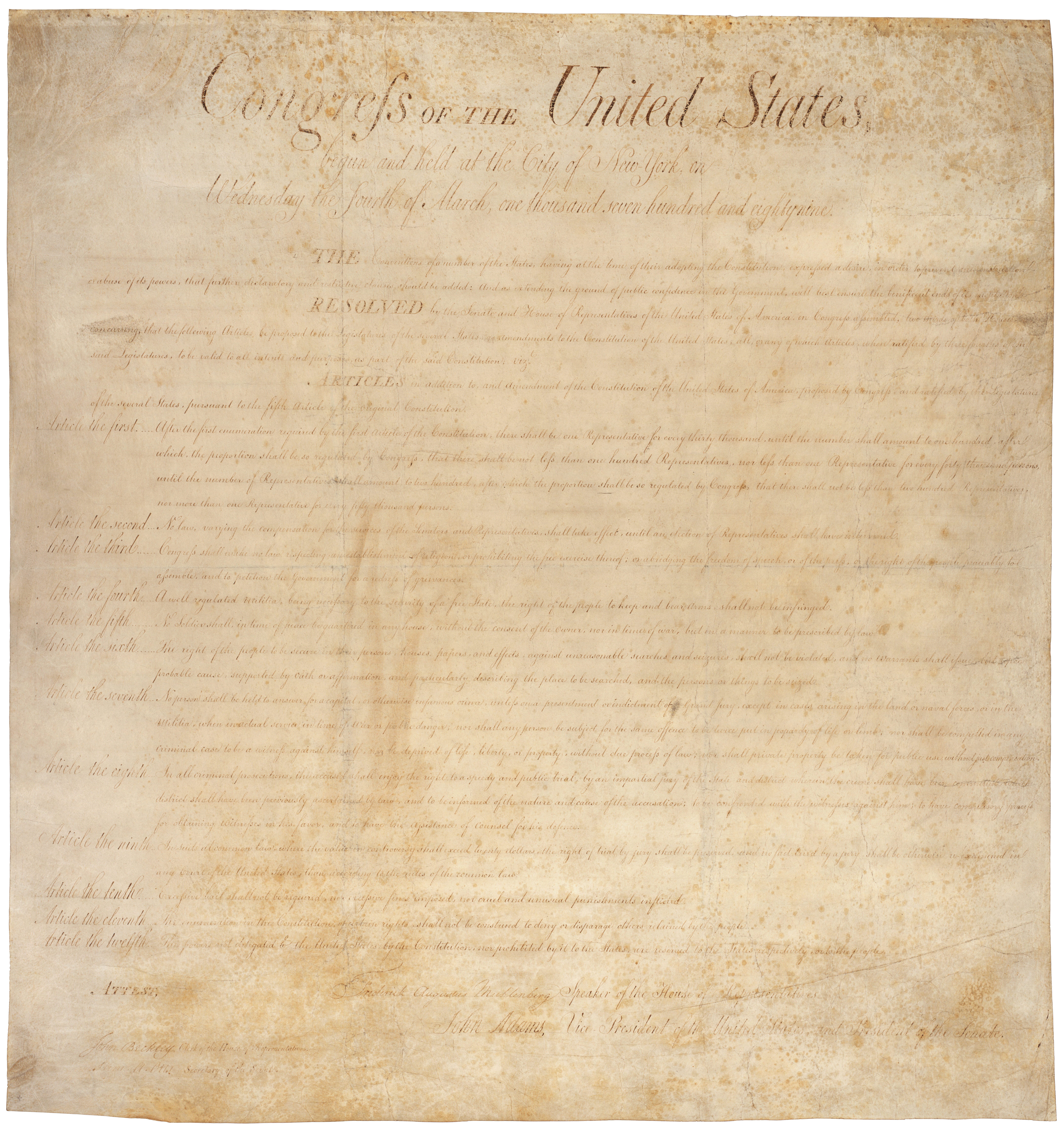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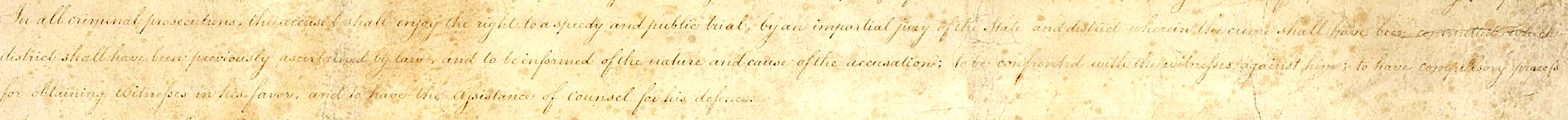
3. 보장되는 권리
3.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특별구의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특별구는 법에 따라 미리 정해져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기소의 성격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se.영어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3. 1. 1. 신속한 재판 권리 침해 여부 판단 기준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미국 대법원은 ''Barker v. Wingo''(407 U.S. 514 (1972)) 판결에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례별 균형 검토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Strunk v. United States''(412 U.S. 434 (1973))에서 대법원은 상소 법원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장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연된 재판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 행위이므로 다른 어떤 구제책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형사 사건이 기각되거나 무효화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추가 기소는 불가능하다.
3. 2.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미국 수정 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권리에는 범죄를 저지른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 공소 사실과 이유에 대한 통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과의 대면, 유리한 증인 확보를 위한 강제 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셰퍼드 대 맥스웰 판결, 프레스-엔터프라이즈사 대 수피리어 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3. 2. 1. 공개 재판의 제한
셰퍼드 대 맥스웰 판결(Sheppard v. Maxwell, 384 U.S. 333 (1966))에서 대법원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피고인의 적법 절차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 재판 절차에 대한 공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프레스-엔터프라이즈사 대 수피리어 법원(Press-Enterprise Co. v. Superior Court, 478 U.S. 1 (1986))에 따르면, 정부의 요청에 따라 "폐쇄가 더 높은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러한 이익을 위해 좁게 맞춰져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압도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피고인 또한 재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첫째, 공개를 막는 폐쇄로 인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둘째, 폐쇄 외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3. 3. 공정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별구는 법에 의해 미리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
3. 3. 1. 배심원 재판의 적용 범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 왔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범죄는 배심원 재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2] 여러 건의 경범죄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총 징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다.[3] 또한 미국에서는 중범죄(예: 살인)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줄어들지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실된다.
원래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 권리는 "영미법에서 이해되고 적용된 대로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 이 나라와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4] 따라서 연방 형사 배심원단은 영국 관습대로 1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차 수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주 법원의 피고인에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대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재검토했다. 12명이라는 배심원 수는 "역사적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며,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충분하지만,[5] 그보다 적은 수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Ramos v. Louisiana''(2020)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가 모든 연방 및 주 형사 배심원 재판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한다고 판결했다.[7]
3. 3. 2. 배심원 구성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가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 왔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범죄는 배심원 재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2] 여러 건의 경범죄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총 징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다.[3] 또한 미국에서는 중범죄(예: 살인)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줄어들지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실된다.
원래 대법원은 미국 수정 헌법 제6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 권리는 "영미법에서 이해되고 적용된 대로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 이 나라와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4] 따라서 연방 형사 배심원단은 영국 관습대로 1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차 수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주 법원의 피고인에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대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재검토했다. 12명이라는 배심원 수는 "역사적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며,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충분하지만,[5] 그보다 적은 수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Ramos v. Louisiana''(2020) 판결에서 대법원은 미국 수정 헌법 제6조가 모든 연방 및 주 형사 배심원 재판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한다고 판결했다.[7]
3. 3. 3. 배심원의 공정성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 왔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범죄는 배심원 재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2] 여러 건의 경범죄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총 징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다.[3] 또한 미국에서는 중범죄(예: 살인)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줄어들지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실된다.
원래 대법원은 6차 수정헌법에 따른 배심원 재판 권리는 "영미법에서 이해되고 적용된 대로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 이 나라와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4] 따라서 연방 형사 배심원단은 영국 관습대로 1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차 수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주 법원의 피고인에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대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재검토했다. 12명이라는 배심원 수는 "역사적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며,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충분하지만,[5] 그보다 적은 수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Ramos v. Louisiana''(2020) 판결에서 대법원은 6차 수정헌법이 모든 연방 및 주 형사 배심원 재판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한다고 판결했다.[7]
미국 수정헌법 제6조는 배심원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공정성은 개별 배심원의 편견 없는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예비심문(voir dire)에서 각 당사자는 잠재적 배심원의 편견 여부를 확인하고, 편견이 발견되면 배심원을 기각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기각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피고인은 만약 배심원 기각(peremptory challenge)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유 있는 기각이 잘못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17년 ''페냐-로드리게스 대 콜로라도주(Peña-Rodriguez v. Colorado)'' 사건에서 대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인종적 편견에 근거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제6조의 요구사항을 판결했다. 배심원의 인종적 편견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려면, 피고인은 인종적 편견이 "배심원의 유죄 평결 투표에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8]
3. 3. 4. 배심원 선정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 왔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범죄는 배심원 재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2] 여러 건의 경범죄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총 징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다.[3] 또한 미국에서는 살인을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줄어들지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실된다.
원래 대법원은 수정헌법 6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 권리는 "영미법에서 이해되고 적용된 대로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 이 나라와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4] 따라서 연방 형사 배심원단은 영국 관습대로 1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차 수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주 법원의 피고인에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대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재검토했다. 12명이라는 배심원 수는 "역사적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며,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충분하지만,[5] 그보다 적은 수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Ramos v. Louisiana''(2020)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6조가 모든 연방 및 주 형사 배심원 재판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한다고 판결했다.[7]
배심원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배심원이 선정되는 패널, 즉 베니어(venire)의 성격이다. 베니어는 지역 사회의 공정한 횡단면을 나타내야 한다. 피고인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지역 사회에서 "뚜렷한" 집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요건이 위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집단의 베니어 내 대표성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수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그러한 대표성 저하는 선정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배제로 인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테일러 대 루이지애나'' 판결에서 대법원은 남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배심원 복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여성을 배심원 복무에서 면제하는 주법을 무효로 하였다.
3. 3. 5. 양형 결정과 배심원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 왔다.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범죄는 배심원 재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2] 여러 건의 경범죄가 관련되어 있더라도, 총 징역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없다.[3] 또한 미국에서는 중범죄(예: 살인)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경우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줄어들지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는 상실된다.
원래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 권리는 "영미법에서 이해되고 적용된 대로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헌법이 채택되었을 당시 이 나라와 영국에서 인정되었던 모든 필수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결했다.[4] 따라서 연방 형사 배심원단은 영국 관습대로 1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14차 수정 조항에 따라 대법원이 주 법원의 피고인에게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대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재검토했다. 12명이라는 배심원 수는 "역사적 우연"으로 정해진 것이며,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충분하지만,[5] 그보다 적은 수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6] ''Ramos v. Louisiana''(2020)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6조가 모든 연방 및 주 형사 배심원 재판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한다고 판결했다.[7]
미국 연방 대법원은 ''뉴저지주 대 애프렌디 판결(Apprendi v. New Jersey)'' 및 ''워싱턴주 대 블레이클리 판결(Blakely v. Washington)''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 또는 무죄 여부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양형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치를 초과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9] ''미합중국 대 앨리니 판결(Alleyne v. United States)''에서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치를 초과하여 피고인의 형량을 증가시키는 모든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배심원 재판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애프렌디'' 및 ''블레이클리'' 판결을 확장했다.[10] ''미합중국 대 헤이몬드 판결(United States v. Haymond)''에서 대법원은 연방 보호관찰 취소가 의무적인 최소 형량의 징역형을 수반하는 경우 배심원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11]
3. 4. 범죄 발생 지역에서 재판받을 권리 (Vicinage)
미국 헌법 제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범죄가 저질러진 주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6조는 배심원이 법률에 따라 확정된 사법구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버스 대 헨켈'' 사건(1904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장소가 재판 장소를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범죄 발생 장소로 여러 구역이 주장되는 경우, 그 중 어느 곳이든 재판 장소로 선택될 수 있다. 어떤 주에서도 저질러지지 않은 범죄(예: 공해상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경우, 재판 장소는 의회가 결정할 수 있다. 다른 수정헌법 제6조의 보장과 달리, 대법원은 근접지역 권리를 통합하지 않았다.
3. 5. 혐의 내용을 통보받을 권리 (Notice of Accusation)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받는 혐의의 성격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미국 수정 헌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영어
3. 5. 1. 기소장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의 성격과 원인을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기소장은 이후의 기소에서 중복 기소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범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12] 대법원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대 카를''(United States v. Carll) 판결에서 "기소장에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법률의 단어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모호한 표현은 법률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피고인에게 기소장 사본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는 없다.[13]
3. 6. 증인 대질권 (Confrontation)
대질조항(Confrontation Clause)은 미국 수정 헌법 제6조에 규정된 권리 중 하나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3. 6. 1. 전문증거 (Hearsay)
대질조항(Confrontation Clause)은 미국 공통법상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관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한 증인의 증언(전문증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진술을 한 사람의 신빙성을 다투고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규칙에는 특정 예외가 허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나 임종선언은 허용된다.[14]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 그린''(California v. Green)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문증거 규칙이 대질조항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문증거는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브루턴 대 미국''(Bruto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허용되지만, 다른 피고인에 대한 전문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문증거는 오래전부터 인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증언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크로퍼드 대 워싱턴''(Crawford v. Washington)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었고 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진술적"(testimonial)인 법정 외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대질조항의 범위를 확대했다.
''데이비스 대 워싱턴''(Davis v. Washington)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술적"이란 진술자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법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만한 모든 진술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멜렌데즈-디아즈 대 매사추세츠''(Melendez-Diaz v. Massachusetts) 및 ''불커밍 대 뉴멕시코''(Bullcoming v. New Mexico)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가 증언하지 않고 검사 화학자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대질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15][16]
''미시간 대 브라이언트''(Michigan v. Bryant)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격 피해자의 누가 자신을 쐈는지에 대한 진술의 "주된 목적"과 경찰이 그를 심문한 이유를 각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된 목적"이 "진행 중인 비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진술은 진술적이 아니므로 대질조항에 따라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증언할 필요는 없다.[17]
증인을 대질하고 반대신문할 권리는 물리적 증거에도 적용된다. 검찰은 배심원에게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방어 측이 그 타당성과 의미를 반대신문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증거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헴필 대 뉴욕''(Hemphill v. New York)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변론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변론을 반박하기 위해 소환된 증인을 반대신문할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8]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이 조항은 침묵의 증인 규칙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19]
3. 6. 2. 증인의 법정 외 진술
대질조항(Confrontation Clause)은 미국 공통법상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관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한 증인의 증언(즉, 전문증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진술을 한 사람의 신빙성을 다투고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규칙에는 특정 예외가 허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나 임종선언은 허용된다.[14]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 그린''(California v. Green)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문증거 규칙이 대질조항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문증거는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브루턴 대 미국''(Bruto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허용되지만, 다른 피고인에 대한 전문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증언이 허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전문증거는 오래전부터 인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다.
''크로퍼드 대 워싱턴''(Crawford v. Washington)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었고 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진술적"(testimonial)인 법정 외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대질조항의 범위를 확대했다. ''데이비스 대 워싱턴''(Davis v. Washington)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술적"이란 진술자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법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만한 모든 진술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멜렌데즈-디아즈 대 매사추세츠''(Melendez-Diaz v. Massachusetts) 및 ''불커밍 대 뉴멕시코''(Bullcoming v. New Mexico)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 화학자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때, 그가 직접 증언하지 않는 것은 대질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15][16] ''미시간 대 브라이언트''(Michigan v. Bryant)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격 피해자가 누가 자신을 쐈는지에 대한 진술의 "주된 목적"과 경찰이 그를 심문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된 목적"이 "진행 중인 비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진술은 진술적이 아니므로 대질조항에 따라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증언할 필요는 없다.[17]
증인을 대질하고 반대신문할 권리는 물리적 증거에도 적용된다. 검찰은 배심원에게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방어 측은 그 타당성과 의미를 반대신문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증거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헴필 대 뉴욕''(Hemphill v. New York)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변론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변론을 반박하기 위해 소환된 증인을 반대신문할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8]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이 조항은 침묵의 증인 규칙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19]
3. 6. 3. 증거 제시
대질조항(Confrontation Clause)은 미국 공통법상의 규칙으로,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관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한 증인의 증언(즉, 전문증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진술을 한 사람의 신빙성을 다투고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규칙에는 특정 예외가 허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자백이나 임종선언은 허용된다.[14]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 그린''(California v. Green)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문증거 규칙이 대질조항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문증거는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브루턴 대 미국''(Bruton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외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허용되지만, 다른 피고인에 대한 전문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문증거는 오래전부터 인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이전 증언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크로퍼드 대 워싱턴''(Crawford v. Washington)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반대신문할 기회가 없었고 고소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진술적"(testimonial)인 법정 외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대질조항의 범위를 확대했다. ''데이비스 대 워싱턴''(Davis v. Washington)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술적"이란 진술자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법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 만한 모든 진술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멜렌데즈-디아즈 대 매사추세츠''(Melendez-Diaz v. Massachusetts) 및 ''불커밍 대 뉴멕시코''(Bullcoming v. New Mexico)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가 증언하지 않고 검사 화학자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대질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15][16] ''미시간 대 브라이언트''(Michigan v. Bryant)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격 피해자의 누가 자신을 쐈는지에 대한 진술의 "주된 목적"과 경찰이 그를 심문한 이유를 각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된 목적"이 "진행 중인 비상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진술은 진술적이 아니므로 대질조항에 따라 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증언할 필요는 없다.[17]
증인을 대질하고 반대신문할 권리는 물리적 증거에도 적용된다. 검찰은 배심원에게 물리적 증거를 제시하고, 방어 측이 그 타당성과 의미를 반대신문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증거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 ''헴필 대 뉴욕''(Hemphill v. New York)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변론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변론을 반박하기 위해 소환된 증인을 반대신문할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8]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이 조항은 침묵의 증인 규칙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다.[19]
3. 7. 증인 소환 요구권 (Compulsory Process)
강제출석조항은 모든 형사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부를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그러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그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20][21]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측 증인의 증언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7. 1. 증언 제한
강제출석조항은 모든 형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부를 권리를 부여한다. 만약 그러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그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할 수 있다.[20][21]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변호측 증인의 증언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전술적 이점을 얻기 위해 검찰에 증인의 신원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그 증인의 증언이 금지될 수 있다.[22]
3.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Assistance of Counsel)
미국 수정 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는 브루어 대 윌리엄스 사건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최소한] 형식적인 고발, 예비 심문, 기소, 정보 또는 기소장 등으로 사법 절차가 개시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23]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절차가 시작된 후 정부가 피고인을 심문할 때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24] 피고인이 체포되어 판사 앞에서 체포 영장에 따라 기소되고 법원에 의해 구금되면, 사법 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23]
3. 8. 1. 국선 변호인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파월 대 알라바마주 사건(287 U.S. 45, 1932)에서 대법원은 "사형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고 무지, 정신박약, 문맹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3] 존슨 대 저브스트 사건(304 U.S. 458, 1938)에서 대법원은 모든 연방 사건에서 스스로 변호인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61년, 대법원은 연방 법원에 적용되는 규칙을 주 법원에 확대 적용했다. 해밀턴 대 알라바마주 사건(368 U.S. 52, 1961)에서 "무지, 정신박약, 문맹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없더라도 사형 사건에서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피고인에게 비용 없이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디언 대 와인라이트 사건(372 U.S. 335, 1963)은 모든 중범죄 사건에서 무산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을 입증해야만 주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베츠 대 브래디 사건(316 U.S. 455, 1942)을 뒤집었다. 아거싱거 대 햄린 사건(407 U.S. 25, 1972)에 따라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모든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즉시 징역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벌에 관하여, 스콧 대 일리노이주 사건(440 U.S. 367, 1979)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알라바마주 대 셸턴 사건(535 U.S. 654, 2002)에서 대법원은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브루어 대 윌리엄스 사건(430 U.S. 387, 197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인의 권리는 "[최소한] 형식적인 고발, 예비 심문, 기소, 정보 또는 기소장 등으로 사법 절차가 개시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3] 브루어 대 윌리엄스 사건는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절차가 시작된 후 정부가 피고인을 심문할 때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24] 그리고 피고인이 체포되고 "판사 앞에서 체포 영장에 따라 기소되고" "법원에 의해 구금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사법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이다.
3. 8.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점
수정 헌법 제6조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Powell v. Alabama영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형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고 무지, 정신박약, 문맹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23] Johnson v. Zerbst영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든 연방 사건에서 스스로 변호인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3]
1961년, 대법원은 연방 법원에 적용되는 규칙을 주 법원에 확대 적용했다. Hamilton v. Alabama영어 사건에서 "무지, 정신박약, 문맹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없더라도 사형 사건에서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피고인에게 비용 없이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3] Gideon v. Wainwright영어 사건은 모든 중범죄 사건에서 무산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상황"을 입증해야만 주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Betts v. Brady영어 사건을 뒤집었다.[23] Argersinger v. Hamlin영어 사건에 따라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모든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23] 즉시 징역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벌에 관하여, Scott v. Illinois영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Alabama v. Shelton영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었던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3]
Brewer v. Williams영어 사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인의 권리는 "[최소한] 형식적인 고발, 예비 심문, 기소, 정보 또는 기소장 등으로 사법 절차가 개시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3] '''브루어'''는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 절차가 시작된 후 정부가 피고인을 심문할 때 법률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24] 그리고 피고인이 체포되고 "판사 앞에서 체포 영장에 따라 기소되고" "법원에 의해 구금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사법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이다.[23]
3. 8. 3. 자기 변호 (Self-representation)
피고인은 법원이 변호인 선임권 포기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타 v. 캘리포니아'' 판결에서 피고인의 자기변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디네즈 v. 모란'' 판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충분히 변론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르티네즈 v.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기변론권이 항소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8년 ''인디애나 v. 에드워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능력은 있지만 자신을 변론할 능력은 없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바운즈 v. 스미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정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이라는 헌법적 권리는 변호인 또는 법률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몇몇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바운즈'' 판결을 법정 접근이 지정된 변호인을 통해 제공된 경우 자기변론 피고인은 자신의 변론을 조사하기 위해 교도소 법률 도서관에 접근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다.[25]
3. 8. 4. 법률 자료 접근권
피고인은 법원이 변호인 선임권 포기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다.[25]
기타 v. 캘리포니아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기변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디네즈 v. 모란 판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을 충분히 변론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르티네즈 v.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기변론권이 항소법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디애나 v. 에드워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능력은 있지만 자신을 변론할 능력은 없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바운즈 v. 스미스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정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이라는 헌법적 권리는 변호인 또는 법률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몇몇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바운즈'' 판결을 법정 접근이 지정된 변호인을 통해 제공된 경우 자기변론 피고인은 자신의 변론을 조사하기 위해 교도소 법률 도서관에 접근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다.[25]
참조
[1]
웹사이트
The Bill of Rights: A Transcription
https://www.archives[...]
Archives.gov
2015-11-04
[2]
판례
District of Columbia v. Clawans
[3]
판례
Lewis v. United States
[4]
판례
Patton v. United States
[5]
판례
Williams v. Florida
[6]
판례
Ballew v. Georgia
[7]
웹사이트
Opinion analysis: With debate over adherence to precedent, justices scrap nonunanimous jury rule
https://www.scotusbl[...]
SCOTUSblog
2020-04-20
[8]
웹사이트
Opinion analysis: Divided court rules for defendant in juror-bias case
http://www.scotusblo[...]
SCOTUSblog
2017-03-06
[9]
웹사이트
Criminal Fines—Applicability of Apprendi v. New Jersey
http://www.nlrg.com/[...]
National Legal Research Group
2011-12-20
[10]
웹사이트
Reconciling ceilings and floors: Alleyne v. United States
http://www.scotusblo[...]
SCOTUSblog
2013-06-17
[11]
웹사이트
Opinion analysis: Divided court throws out additional jail time for sex offender
https://www.scotusbl[...]
SCOTUSblog
2019-06-26
[12]
판례
United States v. Cruikshank
[13]
판례
United States v. Van Duzee
[14]
판례
Kirby v. United States
[15]
웹사이트
Analysis: Law need not bow to chemistry
http://www.scotusblo[...]
SCOTUSblog
2009-06-25
[16]
웹사이트
Bullcoming v. New Mexico Resource Page
http://www.federalev[...]
Federal Evidence Review
[17]
웹사이트
Instant Analysis of Michigan v. Bryant: The Confrontation of Social Cost
http://joshblackman.[...]
2011-02-28
[18]
웹사이트
Justices affirm Crawford's application of Sixth Amendment confrontation clause to testimonial evidence
https://www.scotusbl[...]
SCOTUSblog
2022-01-25
[19]
논문
The Muted Rise of the Silent Witness Rule in National Security Litig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20]
웹사이트
Compulsory Process Clause
http://www.revolutio[...]
[21]
판례
United States v. Cooper
[22]
판례
Taylor v. Illinois
[23]
판례
[24]
판례
Massiah v. United States
[25]
웹사이트
2nd Circuit: Having a Lawyer Satisfies Test for Court Access
http://www.law.com/j[...]
Law.com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