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박열은 1902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이다. 3·1 운동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무정부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흑도회 등을 결성하고, 가네코 후미코와 동거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체포되어 대역죄로 기소되었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한반도로 돌아와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조직하고 이승만 노선을 지지했으나, 한국 전쟁 중 납북되어 북한에서 활동하다 1974년 사망했다. 박열은 아나키즘, 반공주의, 용공으로 사상을 전환하며, 1937년 일본에 대한 전향을 선언하기도 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박열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본명 | 박준식 |
| 출생일 | 1902년 3월 12일 |
| 출생지 | 대한제국 경상북도 문경 |
| 사망일 | 1974년 1월 17일 |
| 사망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세 불명) |
| 한국어 이름 | |
| 한글 | 박열 |
| 한자 | 朴烈 |
| 로마자 표기 | Bak Yeol |
| 한국어 본명 | 박준식 |
| 한자 본명 | 朴準植 |
| 로마자 표기 본명 | Bak Junsik |
| 일본어 이름 | |
| 이름 (일본어) | 朴 烈 |
| 후리가나 | ぼく れつ |
| 가타카나 | パク・ヨル |
| 국적 | |
| 국적 | 대한제국 |
| 교육 | |
| 출신 학교 |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현재 경기고등학교) 사범과 중퇴 |
| 기타 학력 | 일본 도쿄 세이소쿠 영어전문학교 중퇴 |
| 직업 및 활동 | |
| 직업 | 저널리스트, 독립운동가, 정치가, 시인, 저술가 |
| 활동 기간 | 불명 |
| 활동 단체 | 흑로회, 흑우회 |
| 정치 운동 | 독립운동 |
| 이념 | 아나키즘 |
| 가족 관계 | |
| 배우자 | 가네코 후미코(사별), 장의숙 (재혼) |
| 자녀 | 슬하 1남 1녀 (아들 박영일, 딸 박경희) |
| 친척 | 박정식 (첫째 형), 박영식 (둘째 형) |
| 부모 | 박영수 (부) |
| 범죄 및 형벌 | |
| 죄명 | 대역죄 |
| 형벌 | 1926년 3월 25일 사형,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 |
| 범죄자 현황 | 종전으로 석방 |
| 기타 | |
| 수상 |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 |
| 묘소 | 상세 불명 |
2. 생애
박열은 1902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났다. 3·1 운동 이후 경성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고 1919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1919년 10월, 근검정신운동의 일환으로 도쿄로 건너가 신문 배달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여러 급진적인 학생 단체에 가입하여 일본 공산주의자 야마카와 히토시와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를 만났다. 오스기는 박열에게 큰 영향을 주어 무정부주의로 전향시키고 노동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박열은 한국 민족주의를 받아들여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의 해방을 열망했다는 점에서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개인주의와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를 노동 착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국가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 군대, 심지어 천황 자신을 포함한 일본 국가의 모든 모습에 대해 대중들이 직접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1921년 11월, 일본 최초의 한국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도회(黒濤会|Kokutō kai일본어)를 설립했다. 조봉암 등과 함께 이 단체의 주요 인물이 되어 기관지 『흑도』(黒濤|Kokutō일본어)를 편집했다. 『흑도』 창간호에서 박열은 일본인들에게 제국 내 한국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알리고, 두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주의적 편견을 해소하며, 세계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썼다. 그는 사회혁명, 상호부조 실천을 통한 자기 수양,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직접 행동을 사회 건설의 수단으로 보았다. 흑도회는 곧 일본 당국의 주목을 받아 설립 한 달 만에 해산 명령을 받았다.
1922년 9월,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반한 학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경성(현재의 서울)으로 갔다. 그 직후 현지 무정부주의자들이 흑도회의 지방 지부를 설립했지만, 1923년 1월 당국에 의해 해산되었다. 이 여행 중 박열은 일본에서 계획한 행동을 위해 폭탄을 구하려 했다.
1922년 12월, 흑도회는 분열을 겪었고, 공산주의 계열은 북성회, 무정부주의 계열은 흥로회를 설립했다. 1923년 2월, 무정부주의자들은 흑우회로 재편하여 『후토이 센진』이라는 잡지를 발간했다. 이후 박열은 다른 한국과 일본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흑우회의 자매 단체인 후테이샤를 설립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천황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6년 3월 사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같은 해 4월 천황의 자비에 의한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박열은 감형을 거부했지만, 무시당하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1926년 7월 23일 우쓰노미야 감옥에서 가네코 후미코가 사망하자 많은 한국 무정부주의자들이 일본을 떠나 한반도로 돌아왔다. 박열은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옥중에서 보냈다.
1945년 광복 후, 박열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남쪽에 정착했다. 한국 전쟁 중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장에 취임했고,[2] 1966년 6월 잡지 ‘통일평론’에서 “공산주의자와 나”를 발표하고, 반공에서 용공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했다. 1974년 1월 17일에 사망했다.[10]
2. 1.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경상북도 문경에서 박영수(朴英洙)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상주시 함창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세에 서울로 올라와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재학 중에 3·1 운동 만세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퇴학당하고, 1919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세이소쿠가쿠엔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신문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이소쿠가쿠엔 고등학교를 다녔다.[4]1919년 10월, 박열은 근검정신운동의 일환인 근로·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쿄로 이주하였고, 신문 배달을 하며 학업을 지원하였다. 그는 여러 급진적인 학생 단체에 가입하여 일본 공산주의자 야마카와 히토시와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를 만났다. 오스기는 박열의 사상적, 정치적 발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쳐 그를 무정부주의로 전향하게 하고 노동 운동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박열은 한국 민족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의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의 해방을 열망했기 때문이다. 박열은 또한 개인주의와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를 노동 착취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경찰, 군대, 심지어 천황 자신을 포함한 일본 국가의 모든 모습에 대해 대중들이 직접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2. 2. 일본 유학과 아나키즘 활동
1919년 10월, 박열은 근검정신운동의 일환으로 도쿄로 건너가 신문 배달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그는 여러 급진적인 학생 단체에 가입하여 일본 공산주의자 야마카와 히토시와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를 만났다. 오스기는 박열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를 무정부주의로 전향시키고 노동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박열은 한국 민족주의를 받아들여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의 해방을 열망했다는 점에서 스승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개인주의와 허무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를 노동 착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국가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경찰, 군대, 심지어 천황 자신을 포함한 일본 국가의 모든 모습에 대해 대중들이 직접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1920년 1월, 일본에 있는 조선인 고학생들과 노동자 사회의 상부상조를 표면상의 목적으로 하는 동경 조선고학생동우회를 결성해 조직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의열단, 흑우회 등을 조직했다. 박열은 흑도회라는 아나키즘 단체에 가담한 아나키즘 신봉자로 활동하였다.
1921년 11월, 박열은 일본의 무정부주의자 이와사 사쿠타로의 집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최초의 한국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도회(黒濤会|Kokutō kai일본어)를 설립했다. 조봉암, 김약수, 김사국과 함께 그는 이 단체의 주요 인물이 되어 1922년 7월부터 발행한 기관지 『흑도』(黒濤|Kokutō일본어)를 편집했다. 박열은 『흑도』 창간호에서 그 목표가 일본인들에게 제국 내 한국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알리고 궁극적으로 두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주의적 편견을 해소하고 세계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으로 사회혁명, 상호부조 실천을 통한 자기 수양, 그리고 국가에 대한 직접 행동을 고려했다. 이 단체는 곧 일본 당국의 주목을 받았고, 설립 한 달 만에 해산 명령을 받았다.
1922년 9월, 박열은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반한 학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경성(현재의 서울)으로 여행했다. 그 직후 현지 무정부주의자들은 흑도회의 지방 지부를 설립했지만, 1923년 1월 당국에 의해 해산되었다. 여행 중 박열은 일본에서 계획한 행동을 위해 폭탄을 구하려 했다.
1922년 12월까지 흑도회는 분열을 겪었고, 공산주의 계열은 북성회, 무정부주의 계열은 흥로회를 설립했다. 1923년 2월, 무정부주의자들은 흑우회로 재편하여 『후토이 센진』이라는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창간호에서 이 잡지는 한국인들의 상황을 일본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재확인했고, 두 번째 목표(아마도 한국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는 일본 당국에 의해 검열되었다. 두 번째 호에서 박열은 일본의 범아시아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 제국의 강제적인 침략과 한국 식민지화 때문이었으며, "아시아 민족"이라는 개념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번째 호 발행 이후, 일본 당국은 너무 선동적이라고 우려하여 잡지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1923년 7월, 이 잡지는 『현대사회』로 개명되었다. 박열은 네 번째 호에 기고한 글에서 정치와 권력의 개념을 구분하고, 볼셰비키의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의 부상을 예로 들었다. 그러한 새로운 계급의 창출을 피하기 위해 박열은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 행동을 옹호했지만, 반자본주의 행동 개념에서 노동 조합주의와 총파업을 무시했다. 이 글은 한국 무정부주의자들의 공산주의자들과의 결별과 박열의 허무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열은 다른 한국과 일본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흑우회의 자매 단체인 후테이샤를 설립했다. 후테이샤는 눈에 띄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무정부주의를 연구하고 전파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천황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박열과 가네코는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후테이샤의 다른 구성원들은 눈에 띄는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의 눈에 띄지 않았다. 후테이샤의 전 구성원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1925년 단명했던 흑기연맹을 설립했다. 흑기연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이치가야 감옥에 있는 박열과 가네코를 방문했다.
이후, 조선을 병합한 일본에 대한 적의로 무정부주의 활동에 참여하여 흑도회, 불령사(不逞社|ふていしゃ일본어) 등을 결성하고, 신농강 탈주 노동자 살해 사건을 추적하거나 잡지 『굵은 조선인(太い鮮人|ふていせんじん일본어)』(이 제목은 『불령선인』을 나중에 개제(改題)당한 것[4])을 발간했다. 이 기간 동안 조선에서 생활하기도 했던 무정부주의자이자 일본인 사상가인 가네코 후미코와 애인 관계가 되어 동거했다.
2. 3. 불령사 사건과 투옥
1923년 4월, 박열은 불령사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15] 관동대지진 이후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인 부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일본어)와 함께 1923년 10월 히로히토 황태자의 혼례식 때 암살을 기도한 죄로 체포되었다.[15] 불령사가 다이쇼 천황과 히로히토 황태자 등을 폭탄으로 암살하기로 모의했다는 혐의였으나, 사건 자체가 과장, 조작되었다는 설도 있다.[15]1926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15] 가네코 후미코는 1926년 7월 23일 우쓰노미야 형무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15] 박열은 22년 2개월을 복역하고 해방 후 미군에 의해 풀려났다.[15]
박열은 감형에 격노하여 감형 거부를 선언했지만 무시당하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옥중에서 가네코 후미코와 결혼할 의향이었지만, 세 달 후 가네코 후미코는 사망했다. 박열은 지바 형무소에서 장기 복역하고 마지막에는 아키타 형무소로 이감되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인 1945년 10월 27일까지 옥중에서 보내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만 알려졌던 박열이 항일 비밀결사조직인 의열단 단원이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1924년 4월 2일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제8회 신문조서에서 박열이 "피고(박열)는 의열단에 가입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열단과 관계는 있다"고 답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15]
2. 4. 광복 이후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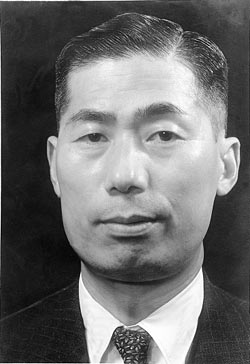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한 뒤, 박열은 석방되어 일본에서 우익 교포 단체인 재일본조선거류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전신)을 조직하고 단장을 맡았다. 이때 저서 《신조선혁명론》(1946)을 남겼고, 이승만 노선을 지지했다.[16]
김구가 모스크바 3국외상회의에 반발하여 강력한 반탁운동을 추진하자, 1946년 12월 30일 결성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위원이 되었다.[16] 이승만과 김구 사이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자 편지를 보내 두 사람의 화해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6년 2월부터 6월까지 김구의 부탁으로 3의사(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유해 발굴 및 봉환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46년 12월과 194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이승만과 회담했다.
1947년 6월, 〈민단신문〉에 '건국운동에서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947년 10월 민단 정기대회에서 이승만 계열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노선을 지지했다.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직후, 민단은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였다.
1948년, 재정 문제와 민단 내 반대파들 때문에 단장직에서 물러났다. 출옥 후에는 무정부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전향했다. 대역죄를 받았다는 명성을 이용하여 재일 조선인 조직 결성을 목표로 1946년에 반공산 조직인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여 위원장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3일에는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여 초대 단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49년 단장 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 대한민국으로 귀국했다. 재선되지 못한 배경에는 동포들 사이에서의 명성만으로 일본 지지를 공식적으로 전향하고, 일본 패전으로 다시 전향한 것에 대한 비판과 전향에 이은 전향으로 평판과 인기가 하락하여 조직 내부에서도 불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8]
2. 5. 납북과 북한에서의 활동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남쪽에 정착했다. 한국 전쟁 중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갔다. 이승만의 초청으로 1949년 귀국하여 한국독립당 당무위원을 지내다가 한독당 탈당 후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다. 북에서 구체적인 활동 자료는 알 수 없다.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2] 1974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명단에 이름이 있으나, 이 단체는 대남 선전과 통일 전략에 납북 인사를 활용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인물들을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동원했던 단체였다.1966년 6월 잡지 ‘통일평론’에서 “공산주의자와 나”를 발표하고, 반공에서 용공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했다. 북한의 남북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나, 1974년 1월 17일에 사망했다.[10] 타나카 세이겐에 따르면, 박열은 그 후 스파이 혐의를 받고 최후에는 처형되었다.[11] 평양시 룡성구역 용궁일동의 “재북인의 묘역”에 매장되어 있다.[12]
3. 사상과 이념적 변화
박열은 1919년 10월 근검정신운동의 일환으로 도쿄로 건너가, 신문 배달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그는 여러 급진적인 학생 단체에 가입하며 일본 공산주의자 야마카와 히토시와 무정부주의자 오스기 사카에를 만났다. 오스기는 박열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를 무정부주의로 이끌었고, 노동 운동에 참여하게 했다.[1]
박열은 한국 민족주의를 받아들여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의 해방을 열망했다. 그는 개인주의와 허무주의의 영향으로 국가를 노동 착취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국가 폐지를 주장하며, 대중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1]
1921년 11월, 박열은 일본 최초의 한국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도회(黒濤会|Kokutō kai일본어)를 설립했다.[2] 조봉암, 김약수, 김사국과 함께 이 단체의 주요 인물이 된 그는 기관지 『흑도』(黒濤|Kokutō일본어)를 편집했다.[3] 박열은 창간호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알리고, 민족주의적 편견을 해소하며, 세계주의적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혁명, 상호부조, 국가에 대한 직접 행동을 수단으로 제시했다.[4] 그러나 흑도회는 곧 일본 당국의 주목을 받아 해산되었다.[5]
1922년 9월, 박열은 경성(서울)으로 건너가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반한 학살 사건을 취재했다. 이후 흑도회의 지방 지부가 설립되었으나, 1923년 1월 해산되었다. 박열은 이 시기 폭탄을 구하려 했다.[6]
1922년 12월, 흑도회는 공산주의 계열의 북성회(北星會|Bukseong hoe한국어)와 무정부주의 계열의 흥로회(興 লু會|Heungno hoe한국어)로 분열되었다.[7] 1923년 2월, 무정부주의자들은 흑우회(黑友會|Heuk-u hoe한국어)로 재편, 『후토이 센진』(不逞船人|Hutoi senjin한국어)을 발간했다.[8] 이 잡지는 한국인들의 상황을 일본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두 번째 목표는 일본 당국에 의해 검열되었다. 박열은 일본의 범아시아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 제국의 침략과 한국 식민지화 때문이었다.[9] 잡지는 이후 『현대사회』로 개명되었다.[10] 박열은 볼셰비키의 "새로운 특권 계급"으로의 부상을 예로 들며 자본주의에 대한 직접 행동을 옹호했지만, 노동 조합주의와 총파업은 무시했다. 이는 한국 무정부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의 결별, 그리고 박열의 허무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주었다.[11]
박열은 다른 한국 및 일본 무정부주의자들과 함께 흑우회의 자매 단체인 후테이샤(不逞社|Huteisha한국어)를 설립했다.[12] 1923년 간토 대지진 이후, 박열과 카네코 후미코는 일본 천황 암살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13]
3. 1. 아나키즘에서 반공주의, 용공으로
박열은 옥중에서 무정부주의자들과 연락하며 옥중 수기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37년 "일본을 위해 살고, 일본을 위해 죽겠다"는 뜻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하고 공순상신서(恭順上申書)를 형무소장에게 제출했다.[5] 박열과 상하이 전선에서 싸우는 일본 해군 육전대 병사와의 편지 교환은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내선융화 선전에 이용되었다.1945년 10월 17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열은 1942년에 어떤 동기로 전향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내심으로부터 공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향 이후 일본인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으므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나는 일본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7]
출옥 후 박열은 무정부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전향했다. 1946년에는 반공산 조직인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여 위원장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3일에는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여 초대 단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49년 단장 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했다. 재선되지 못한 배경에는 일본 지지를 공식적으로 전향하고, 일본 패전으로 다시 전향한 것에 대한 비판과 전향에 이은 전향으로 평판과 인기가 하락하여 조직 내부에서도 불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8]
귀국 후에는 이승만의 권유로 국무위원에 임명되었으나,[9] 1950년 한국 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북한으로 연행되었다.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2]
1966년 6월, 잡지 '통일평론'에서 "공산주의자와 나"를 발표하고 반공에서 용공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했다. 북한의 남북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나, 1974년 1월 17일에 사망했다.[10]
3. 2. 전향 논란
박열은 1937년 "일본을 위해 살고, 일본을 위해 죽겠다"는 뜻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하고 공순상신서(恭順上申書)를 형무소장에게 제출했다.[5] 박열과 상하이 전선에서 싸우는 일본 해군 육전대 병사와의 편지 교환은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내선융화 선전에 이용되었다.1945년 10월 17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열은 "쇼와 17년, 어떤 동기에서 전향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내심으로부터 공순하게 되었다. 전향 이후 일본인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으므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나는 일본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7]
출옥 후, 박열은 무정부주의에서 반공주의로 전향했다. 1946년에는 반공산 조직인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여 위원장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 3일에는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여 초대 단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49년 단장 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했는데, 이는 일본 지지를 공식적으로 전향했다가 일본 패전으로 다시 전향한 것에 대한 비판과 불신 때문이었다.[8]
1966년 6월, 박열은 잡지 '통일평론'에서 "공산주의자와 나"를 발표하며 반공에서 용공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했다. 그는 북한의 남북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10]
4. 평가
박열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활동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사상 전향을 거듭하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26 사건에 가담했던 이케다 토시히코는 박열에 대해 조선 농민을 착취한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악행에 항의하려 했던 것이라며,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6]
광복 후 이승만의 권유로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정계 진출을 시도했으나,[9]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에 의해 북한으로 연행되었다. 1974년 사망 후[10] 평양 용성구역 용궁일동의 “재북인 묘역”에 매장되었다.[12]
4. 1. 부정적 평가
1937년 "일본을 위해 살고, 일본을 위해 죽겠다"는 뜻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하고 공순상신서(恭順上申書)를 형무소장에게 제출했다.[5] 박열과 상하이 전선에서 싸우는 일본 해군 육전대 병사와의 편지 교환은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내선융화 선전에 이용되었다.1945년 10월 17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쇼와 17년, 어떤 동기에서 전향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내심으로부터 공순하게 되었다. 전향 이후 일본인으로 살겠다고 맹세했으므로,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나는 일본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7]
출옥 후 반공주의로 전향하여 1946년 재일 조선인의 반공산 조직인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고 위원장이 되었으며,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결성하여 초대 단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1949년 단장 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했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 지지로 전향했다가 일본 패전으로 다시 전향한 것에 대한 비판과 불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8]
한국 전쟁 중 북한군에 의해 북한으로 연행된 후,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2] 1966년 6월 잡지 ‘통일평론’에서 “공산주의자와 나”를 발표하고, 반공에서 용공으로 사상 전향을 선언했다. 남북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나, 타나카 세이겐에 따르면, 박열은 그 후 스파이 혐의를 받고 최후에는 처형되었다.[11]
5. 저서
6. 관련 작품
참조
[1]
논문
The Prison Memoirs of a Japanese Woman
https://www.jstor.or[...]
[2]
웹사이트
パク・ヨル パク ヨル Pak Yol
https://kotobank.jp/[...]
日外アソシエーツ
2018-02-21
[3]
뉴스
영화 ‘박열’ 때문에…함양박씨, 인기급상승!
http://www.hygn.co.k[...]
2017-07-04
[4]
서적
ニヒルとテロル
[5]
간행물
[6]
서적
生きている二.二六
文藝春秋
[7]
뉴스
日本人として生きたい、と朴烈
朝日新聞
1950-10-19
[8]
서적
新日本文学 第615~619 号
新日本文学会
[9]
서적
世界は日本・アジアをどう伝えているか : 報道検証
連合出版
[10]
논문
資料 1974年1月・2月在日朝鮮人の動向日誌
日本朝鮮研究所
1974-03-15
[11]
서적
田中清玄自伝
文藝春秋
[12]
뉴스
北朝鮮、拉致・越北62人の平壌墓地を公開
http://japanese.dong[...]
2005-06-27
[13]
웹사이트
http://www.ksmnews.c[...]
[14]
뉴스
개교 100년 경기고 신화
http://www.donga.com[...]
신동아
2000-08-00
[15]
뉴스
[단독]박열 "의열단과 관계 있다…내 사상 일치해 제휴" 日재판기록 첫 발견
http://www.newsis.co[...]
뉴시스
2019-07-20
[16]
서적
아! 비운의 역사현장 경교장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17]
뉴스
[단독]박열 의사 부인 '가네코 후미코' 건국훈장, 한국으로 온다
https://news.v.daum.[...]
뉴시스
2019-07-19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권율, 오늘(24일) 비연예인과 결혼…인생 2막 새 출발 | JTBC 뉴스
“간토 조선인학살, 1천년 지나도 없어지는 것 아냐”
한국 독립 투쟁의 숨은 동지들, ‘대한외국인’ [.txt]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