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 규정을 의미하며, 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를 포괄한다. 보험법은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특징으로 하며, 영미법과 민법 국가에서 보험의 개념과 규제가 다르게 나타난다. 보험법의 법원은 상법, 보험업법, 보험 관련 특별법, 관습법 등으로 구성되며, 해상보험을 시작으로 발전해왔다. 보험 계약은 고지의무, 최고의 성실 원칙을 따르며, 보험약관 해석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판례가 존재한다. 보험 산업은 보험 회사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제되며, 대한민국에서는 보험업법, 보험 소비자 보호 제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진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보험법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무 가입이 일반화되었으며, 차량 소유자, 제3자, 차량 자체의 손해 등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 보험법 -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와 풍수해 보상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 보험 - 예측 분석
예측 분석은 통계학, 기계 학습 등의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거 및 현재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의 사건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 지원 및 위험 관리 등에 활용되지만, 인간 행동의 복잡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보험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의무 가입이 일반화되었으며, 차량 소유자, 제3자, 차량 자체의 손해 등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 상법 - 제명
제명은 정치, 종교, 스포츠 등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 수단으로, 일본 국회법, 정당의 당헌·당규, 스포츠 단체의 규정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셀프 제명은 탈당을 통해 의원직 유지를 시도하는 것이다. - 상법 - 주식
주식은 회사의 자본 단위로서 주주에게 경영 참여와 이익 배분 권리를 부여하며, 액면 유무, 종류, 명의, 발행 시점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며, 주가는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고, 투자 이익은 배당과 매매 수익으로 구성되며, 관련 과정 및 권리가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율되는 금융 상품이다.
2. 보험법의 개념 및 특성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보험법은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2. 1. 보험법의 개념
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영미법에서는 상업 보험 계약의 결정적인 개념이 유사한 교섭력을 가진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협상된 위험 이전으로, 법원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만한(혹은 받을 만하지 않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보험인은 보험 증권 조항을 작성함으로써 보상 범위의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잠재적 피보험자는 보험인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험에 가입하려는 정확한 위험을 아는 동등하고 반대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국 상업 보험 판결의 중심에는 보험인이 자신의 보험 증권 조항에 구속되고, 위험이 그에게 설명된 대로이며, 보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진술되지 않았다는 연관된 원칙이 있다.
민법 국가에서는 보험이 일반적으로 위험 분산을 통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취약 계층의 보호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민법 관할 구역은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의 내용을 영미법 관할 구역보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더 유리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은 위험이 협상한 위험보다 더 클 가능성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는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법 체계는 상업 보험 분쟁의 판결에 영미법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위험의 경제적 부담 분담에서 거의 동등한 파트너임을 인정한다.
2. 2. 보험법의 특성
보험법은 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편면적 강행법규성보험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보험, 해상보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보험계약은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상법 보험편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민법 국가에서는 보험이 취약 계층의 보호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보험 계약 내용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보험 계약이 자유롭게 협상된 위험 이전으로 간주된다.
2. 2. 1. 편면적 강행법규성
보험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이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보험, 해상보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2. 2. 2.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보험계약은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기술성'''
'''단체성'''
'''사회성'''
상법 보험편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보험법의 법원(法源)
대한민국 상법 제4편에서는 보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 보험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과 같은 제정법 외에 보험 분야에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습법이 존재한다.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3. 1. 제정법
대한민국 상법 제4편에서는 보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 보험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3. 2. 관습법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과 같은 제정법 외에 보험 분야에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습법이 존재한다.3. 3. 보험약관의 법원성 논란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제정법으로서의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고, 관습법이 있다.4. 보험법의 역사
가장 초기의 보험 형태는 아마도 해상보험일 것이다. 비록 그 이전에도 상호부조(집단 자가보험)의 형태가 존재했지만 말이다. 해상보험은 12세기와 13세기에 한자 동맹의 상인들과 롬바르디아의 금융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런던 시티의 롬바드 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가장 오래된 거래 보험 시장이다.[1] 초기에는 보험이 상업주의의 확장과 신세계에서 금, 은, 향신료, 모피 및 기타 귀중품(노예 포함)의 새로운 원천에 대한 탐험(및 착취)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상인 모험가들에게 보험은 "어떤 배의 손실이나 멸망으로 인해 어떤 사람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손실이 소수보다는 다수에게 더 쉽게 미치게 하는 수단… 그리하여 모든 상인들, 특히 젊은 상인들은 더 기꺼이 더 자유롭게 모험을 감행하도록 유인되었습니다."[1]
영국 해상 무역의 확장으로 런던은 18세기까지 세계 최대의 보험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보험인들은 술집이나 에드워드 로이드가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 새롭게 유행하는 커피숍에 앉아 제안된 상업적 "모험"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제시된 서류에 자신의 "서명"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수반되는 위험을 어느 정도 공유할 것인지 표시했다.
동시에 18세기 판사 윌리엄 머레이 경, 맨스필드는 보험의 실체법을 현재까지 크게 변하지 않은 정도로 발전시켰다. 적어도 상업적 비소비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미법 관할 구역에서 그렇다. 맨스필드는 "외국 당국"과 "지능적인 상인들"에게서 자료를 얻었다.
"그가 상업 세계 전반에서 유행하는 것을 발견한 바다의 관습법과 상인의 관습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러한 주요 원칙들, 그리고 모든 보험 문제가 쉽게 참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의 판결의 엄청난 명성과 외국에서 그의 판결이 존중받는 이유입니다."[2]
19세기가 되자 로이드의 회원 자격이 규정되었고, 1871년 로이드 법이 통과되어 로이드 법인이 회원 또는 "네임"을 위한 시장으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일반 보험법의 집합체가 1904년에 1906년 해상보험법으로 성문화되어 그 이후로 해상 보험법과 비해상 보험법이 분리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4. 1. 한국 보험법의 역사
한국 보험법의 역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가장 초기에는 한자 동맹 상인들과 롬바르디아 금융가들에 의해 해상보험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런던이 세계 최대의 보험 시장의 중심지가 되는 배경이 되었다.[1][2]인도에서는 1912년 인도 생명보험회사법(Indian Life Assurance Companies Act, 1912)을 시작으로, 1938년 보험법(Insurance Act, 1938)이 제정되어 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었다.[6] 1956년에는 생명보험공사법(Life Insurance Corporation Act)에 따라 생명보험이 완전히 국유화되었고, 1972년 일반보험사업법(General Insurance Business Act, 1972)을 통해 일반보험회사들도 국유화되었다. 1999년 보험규제개발청법(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Act) 도입으로 민간 회사와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2015년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 한도가 49%로 상향 조정되었다. 2006년에는 보험계리사법(Actuaries Act)이 통과되었다.
4. 2. 영미법
영미법에서 보험은 한자 동맹 상인들과 롬바르디아 금융가들에 의해 시작된 해상보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1] 18세기 런던은 영국 해상 무역의 확장으로 세계 최대의 보험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고, 보험인들은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숍과 같은 곳에서 상업적 "모험"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위험을 분담했다.[1]윌리엄 머레이 경, 맨스필드는 18세기에 "외국 당국"과 "지능적인 상인들"에게서 자료를 얻어 보험의 실체법을 발전시켰다.[2] 그의 판결은 상업 세계 전반에 걸쳐 유행하는 바다의 관습법과 상인의 관습법의 주요 원칙들을 확립하여, 오늘날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19세기에는 로이드의 회원 자격이 규정되었고, 1871년 로이드 법이 통과되어 로이드 법인이 회원들을 위한 시장으로 설립되었다. 20세기 초, 1906년 해상보험법(MIA)이 제정되어 해상 보험법과 비해상 보험법이 분리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2000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은 영국의 보험 관련 주요 법률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 보험업 규제는 1940년대 여러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작되었다. 1868년 폴 대 버지니아 판결(Paul v. Virginia)[7]에서는 보험 계약이 상업 계약이 아니며 연방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8] 1944년 미국 대 사우스이스턴 언더라이터 협회 판결(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9]에서 이 입장이 변경되어 보험 계약이 상업적이며 규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에서는 각 주에 보험부를 설립하는 법령(statute)이 있으며,[10] 이 기관은 보험회사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 규정(regulations)을 만든다. 보험회사의 규제는 거의 전적으로 주와 그 보험부에서 수행하며, 연방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보험을 연방 규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보험사가 파산(bankruptcy)을 선언하는 경우, 국가 보험 집행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서비스를 운영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한다.[11]
미국과 같이 규제가 심한 곳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의 불성실 청구(bad faith)로부터 보호받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하며, 발급된 계약 및 보험 증권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보험사 간의 가격 담합(price fixing)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취리히 금융 서비스[12]를 비롯한 여러 보험사가 반경쟁적인 방식(Anti-competitive behavior)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사례가 있다.
4. 3. 대륙법
독일에서는 1908년에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이 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976년에 보험관련 제반 법령을 통합하여 보험법전(Le code des assurances)을 편찬하였다.가장 초기의 보험 형태는 해상보험으로,[1] 12세기와 13세기 한자 동맹의 상인들과 롬바르디아의 금융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1] 런던 시티의 롬바드 스트리트는 가장 오래된 거래 보험 시장으로 기록되어 있다.[1] 초기 보험은 상업주의의 확장과 신세계에서 금, 은, 향신료, 모피 및 기타 귀중품(노예 포함)의 새로운 원천에 대한 탐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1]
영국 해상 무역의 확장으로 런던은 18세기까지 세계 최대의 보험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다.[1] 보험인들은 에드워드 로이드가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등에서 상업적 "모험"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제시된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위험을 분담했다.[1]
18세기 판사 윌리엄 머레이 경, 맨스필드는 "외국 당국"과 "지능적인 상인들"에게서 자료를 얻어 보험의 실체법을 발전시켰다.[2]
19세기에 로이드의 회원 자격이 규정되었고, 1871년 로이드 법이 통과되어 로이드 법인이 설립되었다.[1] 20세기 초, 일반 보험법의 집합체가 1904년에 1906년 해상보험법으로 성문화되었다.[1]
5. 보험 계약
대부분의, 그리고 2005년까지 모든 영미법 관할구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보험가능이익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가능이익이란 보험 관계의 존재와는 별개로 피보험자와 보험의 피보험 목적물 사이의 법적 또는 형평적 관계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건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거나, 반대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관계를 의미한다. 보험가능이익은 오랫동안 보험 계약을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구분하고, (명예만으로 구속력 있는) 집행 불가능한 도박 계약과 구별하며, 17세기와 18세기의 낯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생명 보험 가입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보험가능이익 요건은 영국의 해상 보험법 이외의 영역에서는 2005년 도박법 (Gambling Act 2005)의 조항에 의해, 아마도 우연히 제거되었다. 그러나 해상보험법 및 기타 영미법 체계에서는 여전히 요구 사항이며, 소수의 법 체계만이 보험가능이익 원칙에 의존하든, 영미법 체계에서처럼 법원이 피보험자가 실제 손실 이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보상 원칙에 의존하든 관계없이, 피보험자에게 진정한 손실을 야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일반적인 상업 계약에서 보증(warranty)은 계약 조항의 일종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권만 발생한다. 반면 조건(condition)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반대로, 보험 계약에서 사실이나 상태에 대한 보증이 위반되면, 보험사는 위반 시점부터 계약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단순한 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만 발생한다.
5. 1.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또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상법 651조).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위험단체)의 내부에서 위험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또 공동준비재산으로서의 보험료총액과 보험급여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質問表)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구조·사용목적·장소·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고혈압·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病歷)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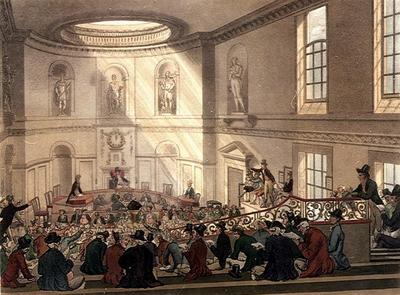
최고의 성실 원칙은 모든 영미법 체계의 보험법에 존재한다. 보험 계약은 최고의 성실 원칙에 따른 계약이다. 영국에서 해석된 이 원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잠재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 중 합리적인 보험사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항이 중요한지는 신중한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와 그 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사가 위험에 대한 중요한 모든 정보를 듣지 못하거나 중요한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무효화(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보험사는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하면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재보험 계약(재보험사와 보험사/피보험자 간)은 최고 수준의 최고의 성실 원칙을 요구하며, 이러한 최고의 성실 원칙은 재보험의 기초로 간주된다. 재보험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보험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보험사의 인수 및 사고 처리 비용을 중복할 수 없으며, 보험사의 절대적인 투명성과 정직성에 의존해야 한다. 그 대가로 재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운명을 따라 보험사의 선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변상해야 한다.
5. 1. 1. 고지의무의 중요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또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상법 651조).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위험단체)의 내부에서 위험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또 공동준비재산으로서의 보험료총액과 보험급여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質問表)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구조·사용목적·장소·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고혈압·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病歷)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최고의 성실 원칙은 모든 영미법 체계의 보험법에 존재한다. 보험 계약은 최고의 성실 원칙에 따른 계약이다. 영국에서 해석된 이 원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잠재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항 중 합리적인 보험사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항이 중요한지는 신중한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와 그 조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사가 위험에 대한 중요한 모든 정보를 듣지 못하거나 중요한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무효화(또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보험사는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하면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재보험 계약(재보험사와 보험사/피보험자 간)은 최고 수준의 최고의 성실 원칙을 요구하며, 이러한 최고의 성실 원칙은 재보험의 기초로 간주된다. 재보험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재보험사는 비용이 많이 드는 보험사의 인수 및 사고 처리 비용을 중복할 수 없으며, 보험사의 절대적인 투명성과 정직성에 의존해야 한다. 그 대가로 재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운명을 따라 보험사의 선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적절하게 조사하고 변상해야 한다.[4][5]
5. 1. 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또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상법 651조).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보험관계에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위험단체) 내부에서 위험 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공동 준비 재산으로서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 급여 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 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한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 제도의 존재 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質問表)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목적의 물리적 성상·구조·사용 목적·장소·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人保險)에서는 피보험자의 결핵·고혈압·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 병력(病歷)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
5. 2. 보험약관
5. 2. 1.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약관의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5. 2. 2. 불공정 약관 조항
보험약관 중 불공정한 조항은 법적으로 규제되며, 피해를 입은 계약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5. 3. 보험금 지급
5. 3. 1.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현재 제공된 정보에 나와 있지 않다.5. 3. 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일에 시작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6. 보험 관련 분쟁 및 판례
대법원 2004다18903 판결은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해당 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1990년대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금융기관종합보험은 직원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 해당 보험계약은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다.
# 보험계약 당사자(중소기업은행, LG화재)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하였다.
6. 1. 대한민국 주요 판례
대법원 2004다18903 판결은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해당 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990년대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금융기관종합보험은 직원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 해당 보험계약은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다.
# 보험계약 당사자(중소기업은행, LG화재)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결하였다.
6. 1. 1. 고지의무 위반 관련 판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가 나타나면, 그 내용을 분석하여 법적 쟁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6. 1. 2.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
- 대법원 1974.12.10 선고 73다1591 판결
-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1109 판결
- 대법원 1984.1.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 서울고법 1985.11.13 선고 85나1676 판결
- 대법원1987.4.14. 선고 87도153 판결
- 대법원 1987.7.21 선고 1987다카831 판결
- 대법원1988614선고1987다카2276 판결
- 대법원1988524선고1987다카3133 판결
- 대법원1989131선고1987도2172 판결
- 대법원19891010선고1989도감117 판결
- 대법원198959선고1988도1288 판결
- 대법원1989926선고1988도2111 판결
- 대법원1989131선고1987도2172 판결
- 대법원1989328선고1988다4645 판결
- 대법원19891128선고1988다카33367 판결
- 대법원1989425선고1987다카1669 판결
- 대법원19891114선고1988다카29177 판결
- 대법원1990626선고1989도2537 판결
- 대법원199029선고1989다카21965 판결
- 대법원1990427선고1989다카24070 판결
- 대법원19901211선고1990다카26553 판결
- 서울민지법19901031선고1990가단15905 판결
- 대법원19911210선고1990다10315 판결
- 대법원199179선고1991다14291 판결
- 대법원1991813선고1991다18712 판결
- 대법원19921124선고1991다47109 판결
- 서울민사1992130선고1991가합54300 판결
- 대법원19921023선고1992다28259 판결
- 대법원1992512선고1992다4345 판결
- 대법원19921124선고1992다28631 판결
- 대법원1992121선고1990다카2549 판결
- 대법원1992818선고 91다38297 판결
- 대법원199339선고1992도3417 판결
- 대법원19931224선고1993도2540 판결
-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45261 (본소)판결
-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45278 (반소)판결
-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52085 판결
- 대법원1993413선고1992다52092 판결
- 대법원1993713선고1992다39822 판결
- 대법원1993629선고1993다1770 판결
- 대법원1993413선고1993다3622 판결
- 대법원1993511선고1992다2530 판결
- 대법원199329선고1992다31101 판결
- 대법원1993119선고1993다23107 판결
- 서울민사지법199382선고1993가단79085 판결
- 대법원19941014선고1994다17970판결
- 대법원199499선고1994다16663판결
- 대법원1994527선고1994다6819판결
- 대법원1994812선고1994다2145판결
- 대법원1994624선고1994다14414판결
- 대법원19941025선고1993다39942판결
- 대법원199499선고1994다18003판결
- 대법원1994913선고1994다15332판결
- 대법원1994429선고1993다55180판결
- 대법원1994823선고1993다59595판결
- 대법원19941125선고1994다32917판결
- 대법원1994126선고1993다37991판결
- 대법원1994826선고1994다4073판결
- 대법원19941227선고1993다29396판결
- 대법원1995811선고1994다52492판결
- 대법원19951116선고1994다56852판결
- 대법원1995526선고1994다60615판결
- 대법원1995725선고1994다52911판결
- 대법원1995531선고1996다10454판결
- 대구지법1995222선고1994가단861판결
- 대법원1995725선고1995다17267판결
- 대법원19961223선고1996다27971판결
- 대법원1996726선고1995다52505판결
- 대법원1996528선고1996다6998판결
- 대법원1996531선고1996다10454판결
- 대법원19961122선고1996다37084판결
- 서울고법1997625선고1996나38744판결
- 대법원19971028선고1997다33089판결
- 대법원1997530선고1995다14800판결
- 대법원19971024선고1997다20229판결
- 대법원1997411선고1996다32263판결
- 대법원1997228선고1996다53857판결
- 대법원 1997930선고97다24276판결
- 대법원19981127선고1998다32564판결
- 대법원1998428선고1997다11898판결
- 서울지법199899선고1997나14001판결
- 대법원 1998414선고1997다39308판결
- 대법원 19981124선고 1998다25061 판결
- 대법원 199894선고 1998다22604판결
- 대법원 199894선고 1998다22611 판결
- 대법원 1998.3.27선고 97다48753 판결
- 대법원1999622선고 98다11451 판결
- 대법원1999427선고 98다54830판결
- 대법원1999427선고 98다54847판결
- 대법원1999511선고 98다59842판결
- 대법원199997선고 98다19240판결
- 대법원19991126선고 99다37474판결
- 대법원1999611선고 99다3143판결
- 대법원1999119 선고 99다49293판결
- 울산지법19991222선고 99나3358 판결
- 대법원1999713선고 98다63162 판결
- 대법원199993선고1999다10349판결
- s:대법원1999514선고1998다58283판결
- s:서울지법1999610선고1998가합70264판결
- s:대법원1999426선고1996다4909판결
- s:대법원200074선고1998다62909판결
- s:대법원2000530선고1999다66236판결
- s:대법원2000822선고2000다21345판결
- s:대법원20001124선고1999다42643판결
- s:대법원2000323선고1999다66878판결
- s:대법원2000128선고1999다50712판결
- s:대법원2000211선고1999다50699판결
- s:대법원2000623선고2000다9116판결
- s:서울지법2000831선고1999나69012판결
- s:대법원2000421선고1999다72293판결
- s:대법원2000121선고1999다41824판결
- s:대법원200098선고2000다89판결
- s:대법원20001010선고2000다32352판결
- s:대법원2000530선고1999다66236판결
- s:대법원2000225선고1999다40548판결
- s:대법원2001918선고2001다14917판결
- s:대법원2001918선고2001다14924판결
- s:대법원2001727선고1999다55533판결
- s:대법원200115선고2000 다31847판결
- s:대법원20011127선고1999다33311판결
- s:대법원20011228선고1999다14037판결
- s:부산고법2001622선고2000나13610판결
- s:대법원200129선고2000다55089판결
- s:대법원2001213선고1999다13737판결
- s:대법원2001914선고1999다42797판결
- s:대법원20011023선고2001다2372판결
- s:대법원2001119선고2001다55499판결
- s:대법원2001119선고2001다55505판결
- 서울지법20011213선고2001나36831판결
- s:대법원200296선고2002다30206판결
- s:광주고법2002417선고2001나7758판결
- s:대법원2002326선고2001다6312판결
- s:서울지법2002820선고2001가합53429판결
- s:대법원200296선고2002다32547판결
- s:대법원2002628선고2002다22106판결
- s:대법원2002628선고2002다22106판결
- s:대법원2002418선고1999다38132판결
- s:대법원2002924선고2002다27620판결
- s:대법원200218선고2001다62251판결
- s:대법원2002329선고2001다49234판결
- s:대법원20021011선고2002다564판결
- s:대법원2003822선고2003다27054판결
- s:대법원2003530선고2003다15556판결
- s:대법원20031211선고2001다33253판결
- s:대법원20031023선고2002다26320판결
- s:대법원2003124선고2002다33496판결
- s:대법원2003425선고2002다64520판결
- s:대법원20031113선고2001다49623판결
- s:대법원20031023선고2001다18285판결
- s:대법원2003110선고2000다41653판결
- s:대법원2003110선고2000다41660판결
- s:인천지법2003425선고2001 가합8604판결
- s:대법원20031226선고2002다61958판결
- s:대법원2003722선고2003다24451판결
- s:대법원2003610선고2002다63312판결
- s:대법원2004427선고2003다7302판결
- s:대법원20041125선고2004다28245판결
- s:대법원2004820선고2002다20899판결
- s:대법원2004820선고2003다26075판결
- s:대법원2004611선고2003다18494판결
- s:대법원20041111선고2003다30807판결
- s:대법원20041111선고2003다30807판결
- s:대법원20041224선고2004다20265판결
- s:대법원2004423선고2003다62125판결
- s:대법원200479선고2003다29463판결
- s:대법원2005625선고2003다60592판결
- s:대법원2005107선고2005다28808판결
- s:대법원2005129선고2004다26164판결
- s:서울고법2005525선고2004나84339판결
- s:대법원2005825선고2004다18903판결
- s:대법원2005714선고2004다36215판결
- s:대법원20051110선고2005다38249판결
- s:대법원2005728선고2005다23858판결
- s:대법원200569선고2005다15444판결
- s:대법원2005310선고2003 다61580판결
- s:대법원2005128선고2002 두12052판결
- s:부산고법2005527선고2005나1216판결
- s:대법원2005819선고2002다59764판결
- s:대법원2005429선고2004다57687판결
- s:대법원2005107선고2003다6774판결
- s:대법원2005114선고2003다38573판결
- s:대법원2005114선고2003다38580판결
- s:대법원2005128선고2003다40729판결
- s:대법원2005325선고2004다71232판결
- s:대법원2005915선고2005다10531판결
- s:대법원2005129선고2003다9742판결
- s:대법원2006630선고2006다19672판결
- 대법원2006630선고2006다19689판결
- 대법원2006126선고2005다60017판결
- 대법원2006126선고2005다60024판결
- 대법원20061123선고2004다45356판결
- 대법원20061013선고2004다16280판결
- 대법원2006126선고2004다19104판결
- 부산지법2006512선고2005가합13991판결
- 대법원 20061123선고2004다20227판결
- 대법원 20061123선고2004다20234판결
- 대법원 20061123선고2006다29853판결
- 대법원 2006928선고2004다48768판결
- 대법원 2006630선고2005다21513판결
- 대법원 2006413선고2005다77305판결
- 대법원 2006413선고2005다77312판결
- 대법원 20061110선고2005다35516판결
- 대법원 2006113선고2005다46431판결
- 대법원 2006427선고2003다60259판결
- 대법원 2006922선고2004다56677판결
- 대법원 2006922선고2004다56677판결
- 대법원 2006629선고2005다11602판결
- 대법원 2006629선고2005다11619판결
- 대법원 2006310선고2005다49713판결
- 대법원 2006119선고2005다55817판결
- 대법원 20061013선고2006다35896판결
- 대법원 2006119선고2005다55817판결
- 대법원 2007928선고2005다5598판결
- 대법원 2007427선고2006다87453 판결
- 대법원 20071026선고2006다39898 판결
- 대법원 2007222선고2006다72093 판결
- 대법원 20071227선고2006다29105 판결
- 대법원 20071227선고2007다54450 판결
- 대법원 20071228선고2007다54351 판결
- 대법원 2007426선고2006다54781 판결
- 대법원 2007315선고2004다64272 판결
- 대법원 20071025선고2005다15949 판결
- 대법원 200729선고2006다28553 판결
- 대법원 2007112선고2006다43330 판결
- 대법원 2007125선고2006다60793 판결
6. 1. 3. 보험약관 해석 관련 판례
보험약관의 해석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험자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작성자(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약관 작성의 주도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능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특정 계약자의 주관적인 사정이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 축소해석 금지의 원칙: 보험약관의 조항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약관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
6. 2. 국제적 분쟁 해결
7. 보험 산업 규제
보험 사업을 규율하는 보험 규제는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자본금, 준비금 정책, 요율 및 기타 다양한 "관리 부문" 프로세스를 규율한다.
7. 1. 대한민국 보험업법
7. 1. 1.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보험 사업을 규율하는 보험 규제는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자본금, 준비금 정책, 요율 및 기타 다양한 "관리 부문" 프로세스를 규율한다.7. 1. 2. 보험 소비자 보호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 규제: 보험약관은 보험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그러나 보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보험약관을 규제하여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보험회사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분쟁 조정 제도: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는 분쟁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 당사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대한민국 정부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청구 간편 서비스"를 통해 여러 보험회사에 한 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보험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보험 불완전판매 방지: 보험 불완전판매는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보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7. 2. 국제적 규제 동향
유럽 연합(EU) 회원국들은 각자 보험 규제 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EU 규정은 연합 전체에 걸쳐 조화된 건전성 규제 체계를 설정한다. 유럽 조약에 따라, 프루덴셜 규제 당국과 금융 행위 당국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다른 회원국에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경 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패스포팅"(passporting)이라고 한다.미국의 보험업 규제는 1940년대 여러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작되었다.[7] 1868년 Paul v. Virginia 판결에서는 보험 계약이 상업 계약이 아니며 연방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7] 1944년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ociation 판결에서 이 입장이 변경되어 보험 계약이 상업적이며 규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9] 각 주에는 보험부를 설립하는 법령이 있으며, 이 기관은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행정 규정을 만든다.[10] 연방 정부는 대부분 보험을 연방 규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10]
보험사 파산 시, 많은 국가에서 독립적인 서비스 및 규제를 운영한다.[11] 미국에서는 국가 보험 집행관 협회가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한다.[11] 규제 범위는 보험회사와 자본 적정성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넘어, 보험 계약자 보호, 보험료 적정성, 계약 및 보험 증권의 최소 기준 충족 등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불성실 청구, 가격 담합, 사기 또는 기망 행위는 규제 기관의 벌금 부과나 보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12]
모든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 제공을 규제한다. 일부 국가는 자국민이 해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현지 규제를 받지 않는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제한한다.
7. 3. 보험감독기관
8. 보험과 사회
8. 1.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보험
8. 2. 보험과 금융 소비자 보호
8. 3. 보험과 윤리
참조
[1]
법률
Act of Parliament
1601
[2]
서적
Treatise on the Law of Insurance
1823
[3]
판례
Carter v Boehm
1766
[4]
논문
Reinsurance as Governance: Governmental Pools as a Case Study in the Governance Role Played by Reinsurance Institutions
https://ssrn.com/abs[...]
2014
[5]
웹사이트
Insurance Law - 7 major principles of Insurance: Free Notes
https://www.prolawct[...]
2020-12-15
[6]
웹사이트
The Insurance Act 1938
http://www.irdaindia[...]
2016-07-01
[7]
웹사이트
FindLaw'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case and opinions.
http://caselaw.lp.fi[...]
2018-04-15
[8]
서적
The political economy of regulation: the case of insurance
https://archive.or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8
[9]
웹사이트
United States v. South-Eastern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1944)
http://www.vlex.us/c[...]
2018-04-15
[10]
웹사이트
State Insurance Agencies and Commissioners in US - Burial Insurance
https://burialinsura[...]
2015-08-13
[11]
웹사이트
NCIGF -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Guaranty Funds
http://www.ncigf.org
2018-04-15
[12]
뉴스
Zurich, 9 States Settle Bid-Rigging Case for $171 Million
http://www.insurance[...]
2006-03-19
[13]
백과사전
보험법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