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훼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느님의 고유한 이름으로 사용되는 네 개의 자음 YHWH를 가리키며, 그 발음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야훼"로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 야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숭배되며, 유대교에서는 "아도나이"로, 기독교에서는 "주"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야훼 신앙의 기원에 대해서는 겐족 가설 등 여러 학설이 존재하며, 고대 이스라엘 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신명사문자 - 야 (기독교)
기독교에서 '야'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축약형으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짧은 형태로 나타나며 '할렐루야'와 같은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라스타파리 운동에서는 '자'로 불리며 하이레 셀라시에 1세를 지칭하기도 한다. - 중동의 신 - 타니트
타니트는 서지중해 지역에서 숭배받았던 여신으로, 전쟁, 다산, 보호를 상징하며, 바알 함몬과 함께 숭배되었고, 삼각형 위에 원이 있는 상징으로 표현된다. - 중동의 신 - 자바바
자바바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키시의 수호신이자 전쟁의 신이며,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고 왕의 원정을 수호하며 맹세의 신으로 숭배받았고, 메소포타미아 외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 야훼 - 여호와
여호와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 테트라그라마톤(יהוה, YHWH)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 중 하나로, 정확한 발음은 불확실하지만 '야훼'라는 가설이 유력하며, '여호와'라는 표기가 널리 사용되지만, 발음과 표기에 대한 논쟁과 함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더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 야훼 - 유대교의 신
유대교의 신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테트라그라마톤(יהוה)으로 표현되지만 '하솀'이나 '아도나이'로 불리며, 창조성, 전지성, 전능성, 편재성, 무형성 등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격신과 비인격신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 야훼 | |
|---|---|
| 개요 | |
| 이름 | 야훼 |
| 영어 | Yahweh |
| 다른 이름 | 엘, 엘 샤다이, 여호와, 알라 |
| 신화 | 가나안 신화 |
| 역할 | 날씨와 전쟁의 신 |
| 숭배 |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
| 숭배 중심지 | 예루살렘 |
| 경전 | 성경 |
| 배우자 | 아세라 |
| 메소포타미아 동등신 | 엘 |
| 민족 | 히브리인 |
| 이미지 | |
 | |
| 언어별 표기 | |
2. 이름
## 이름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느님의 고유 이름으로 사용된 4개의 자음 YHWH를 가리키며, 이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도 한다.[97]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표기되지 않아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으나, 학계에서는 "야훼"로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1] "여호-", "야후-", "야-", "요-"와 같은 축약형이 인명이나 "할렐루야!"와 같은 구절에 나타난다.
고대 히브리어로 (정자체로는 )로 쓰이며, YHWH로 음역된다.
### 발음 논쟁
고대에는 모음 없이 자음만 표기했기 때문에 YHWH의 원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야훼'는 "~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하얗/הָיָהhe의 사역형, 미완료 시상으로 해석하면 "그가 ~이 되게 한다", 즉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신의 이름을 직접 발음하는 것을 꺼렸고,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따라 신성한 이름은 문자로만 표기하게 되면서 원래 발음은 잊혀졌다.
중세 유대인들은 마소라 본문을 편찬하며 모음을 표기했지만, YHWH에 '주'(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모음을 첨가하여 읽는 사람이 '아도나이'로 읽도록 했다. 현대 성경 편집자들도 이를 따라 창조주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굵은 글씨로 'the LORD, 주님'으로 바꾸기도 한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를 뜻하는 '할렐루'와 '야훼'의 축약형인 '야'의 합성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는 의미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야 또는 -야후로 끝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 발음에 가깝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Ιαβεel라는 표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로마자로는 YHWH, YHVH, JHWH, JHVH 등으로 표기하며, 독일에서는 JHWH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 "엘로힘"으로 대체했다. 야훼는 발음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하게 여겨져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나 '하쉠'(그 이름)[98]으로 불렸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이라 발음하는 대신, 본문에 써 있는 바대로 여호와란 발음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르네상스 이후 일부 기독교 학자들에게 채택되었다.[99]
빌헬름 게제니우스(1786~1842)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과 신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를 가장 사실적인 발음으로 제안했다.[100]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성경 학계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99]
### 신성성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야훼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꺼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이 신성하므로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그 결과 정확한 발음은 잊혀지고 문자로만 표기하게 되었다.
중세 시대 마소라 학자들은 통일된 발음의 성경을 편찬하면서 모음을 표시했지만, 야훼에 대응되는 모음 대신 '주'(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모음을 첨가했다. 십계명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색한 발음의 단어를 읽을 때, 독자들은 창조주의 이름이 적힌 곳을 '아도나이'(주)로 읽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현대 성경 편집자들도 야훼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굵은 글씨로 'the LORD, 주님'으로 바꾸기도 한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를 뜻하는 ‘할렐루’와 ‘야훼’의 축약형인 ‘야’의 합성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야 또는 -야후로 끝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이 원래 하느님의 이름 발음에 가깝다고 추정된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Ιαβεel라는 표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4개의 자음 YHWH로 쓰인 하느님의 고유 이름이며, 정확한 발음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4글자 단어 자체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불린다.[97] 유대인들은 그리스-로마 시대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 "엘로힘"으로 대체했다. 야훼는 발음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하게 여겨져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나 '하쉠'(그 이름)[98], 또는 '솀 하메포라쉬'(거룩한 이름)로 불렸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이라 발음하는 대신, 본문에 써 있는 바대로 여호와란 발음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발음은 르네상스 이후 일부 기독교 학자들에게 채택되었다.[99]
빌헬름 게제니우스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과 신명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를 가장 사실적인 발음으로 제안했다.[100]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성경 학계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99]
유대인들은 영창 시에도 야훼 대신 아도나이(אֲדֹנָי)로 바꿔 읽는 등 야훼(יהוה)의 이름 발음을 피해 왔다. 현재도 유대인들은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אֲדֹנָי) 또는 하셰엠(הַשֵּׁם, Hašem) 등으로 부른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 중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구절 때문에 신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해석이 생겨났다. 이는 본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야훼의 이름을 연호하여 주문으로 삼거나, 야훼의 이름을 입에 대고 맹세한 후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름의 발음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남유다 왕국 붕괴부터 바빌론 포로 시대까지 쓰여진 『라키시 서간』에는 יהוהhe가 자주 나타나, 이 시대까지도 야훼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에 공공장소에서 야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기 시작했고,[51] 대신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아도나이(אֲדֹנָי, "나의 주")라는 단어로 바꾸기 시작했다. 로마 시대 예루살렘 포위전과 성전 파괴 이후인 서기 70년에 신의 이름의 원래 발음은 완전히 잊혀졌다.[51]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도 야훼라는 이름 대신 "하늘 아버지" 등으로 표현했다는 설이 있다.
기원전 3세기 초부터 번역이 시작된 『칠십인역 성서』에서는 히브리어의 "יהוהhe (야훼)"가 대부분의 구절에서 "주"를 의미하는 "Κύριοςel (퀴리오스)"로 번역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40년대에 발견된 기원전 1세기의 파피루스 파드 266호에는 신의 이름이 히브리어의 오래된 정방형 문자로 쓰여 있었다.
또한, 사해 사본의 일부인 기원전 1세기의 레위기 26장의 그리스어 단편 4Q120에는 신의 이름이 그리스어 형태로 ιαω(이아오)로 음역되어 있다.
1961년 나할 헤베르에서 발견된 1세기의 칠십인역 사본 단편인 칠십인역 VTS10a와 칠십인역 VTS10b, 칠십인역 IEJ12에도 고대 히브리어로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52].
이집트 옥시린쿠스에서 발견된 P3522 단편은 1세기의 것으로, 욥기 42장 11, 12절이 기록되어 있으며, 거기에 신의 이름이 고대 히브리 문자로 쓰여 있었다. 이러한 최고(最古)의 사본 단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폴 E. 카일 박사는 "그리스도교 시대 이전의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에 의해 번역된 그리스어 성서 모두는, 신의 이름으로 히브리어 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53]. 신약 신학 신국제 사전은 "본문에 관한 최근의 발견은, 칠십인역 편찬자들이 사문자어 YHWH를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칠십인역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사문자어가 그리스어 본문 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관습은 구약을 번역한 후대의 유대인 번역자들에 의해 1세기에 계승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54].
2. 1. 어원과 표기
고대 히브리어에서 야훼는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YHWH로 표기되었으며, 원래 발음은 정확히 알 수 없다.[97] "~이 되다"(become)라는 뜻의 하얗/הָיָהhe의 사역형으로, 미완료 시상으로 해석하면 "그가 ~이 되게 한다" 즉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신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문자로만 표기하게 되었고, 원래의 정확한 발음은 잊혀졌다.중세 유대인들은 마소라 본문을 편찬하며 모음을 표시했지만, 십계명을 잘못 해석하여 YHWH에 ‘주’(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모음을 첨가했다. 마소라 본문을 읽는 독자는 YHWH를 '아도나이'로 읽도록 한 것이다. 현대 성경 편집자들도 이 전통을 따라 YHWH를 'the LORD, 주님'으로 바꾸고 있다. 할렐루야는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뜻이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야 또는 -야후로 끝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이 원래 하느님의 이름 발음에 가깝다고 추정된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Ιαβεel라는 표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로마자로는 YHWH, YHVH, JHWH, JHVH 등으로 표기하며, 독일에서는 JHWH로 통일해서 쓴다.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4문자 YHWH로 쓰여진 하느님의 고유 이름이며, 이 4글자 단어 자체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른다.[97]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엘로힘"으로 대체했으며,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 또는 '하쉠'(그 이름)[98]으로 불렀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이라 발음하는 대신, 본문에 써 있는 바대로 여호와란 발음을 사용하기도 했다.[99]
19세기에 히브리 학자 빌헬름 게제니우스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 신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를 가장 사실적인 발음으로 제안했다.[100] 그 결과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99]
야훼(YHWH)의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어근(√היה (√hyh))과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אני הוה אני)라고 응답한 데서 비롯된다. “나는 있다”(אני הוה (’ehyeh))라는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 미완료 시상 형태인 “그는 있다”로 하면 הוא הוה (yihyeh)가 되며, הואיה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 여기서 야훼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온 한마디”,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실존하는 것”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히브리인들은 맹세할 때 “주는 살아 계시다”라는 관용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야훼를 “생생하게 실존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에 따라 유대인, 그리스도교인, 무슬림은 어둠이 주요 요소가 되는 우주를 건설한 존재를 야훼(하느님, 알라)라고 생각한다. 히브리어로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엘(אל)로 표기한다.[55]
הוה의 히필(使役) 태 3인칭 단수 남성 미완료 형태가 יהוה (yahyeh)가 되어, “야훼”와 같은 모음 조합이 된다. 여기서 그 이름을 “존재하게 하는 자”, “창조주”로 해석하기도 한다.
에 따라 일본어의 전통적인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메이지 원역 성서』와 함께 보급되어 일본의 사상과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58] 헤본 등에 의해 1887년에 완성된 『메이지 원역 성서』 구약성서 부분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여호와의 증인도 신세계역 성서를 사용하기 전까지 이 번역을 사용했다. 시즈오카현후지노미야시후모토에는 일본 여호와교단이라는 문부과학대신 관할 포괄 종교법인이 있다.[59]
“에호바” 또는 “ヱ호바”라는 읽기(표기)는 일본 문학에서도 애용되어 왔다. 가톨릭 하이쿠 시인 아와노 세이보의 하이쿠 "은하로부터 듣겠네 에호바의 속삭임을"이 그 예이다.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 중에는 신의 이름이 사용된 번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히브리어 학 교수 엘리아스 훽터는 12개 언어를 대조한 뉘른베르크 다국어 대조 성경[60]을 만들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 란에 신의 이름 יהוה를 200회 이상 사용했다. 또한, 1864년에 허먼 하인페터는 「신약 성경」을 출판하여 신약 성경에서 신의 이름을 “Jehovah”(에호바)로 번역하여 100회 이상 사용했다.
여호와의 증인의 번역인 『신세계역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에서 “에호바”를 사용하고 있다. 신약의 그러한 번역 방식에 대해 “신의 이름을 복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번역 방식을 지지하는 여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61]. 그러나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교정 본문이나 고대 번역, 교부 문서에도 신의 이름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세계역』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62].
일본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기원을 같이 하는 등대사(燈臺社) 회원은 전시 중 아카시 준조 주간의 번역에 의해 “여호와의 증거자”라고 불렸고,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으로 바뀌었다.
2. 2. 발음 논쟁
야훼는 모음 없이 자음만 표기하던 고대 본문에서는 YHWH로만 표기되어 원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야훼'는 "~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하얗/הָיָהhe의 사역형이며 미완료 시상으로 해석하면 "그가 ~이 되게 한다", 즉 전능자라는 의미를 가진다.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 신의 이름을 직접 발음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따라 신성한 이름은 문자로만 표기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래 발음은 잊혀졌다. 중세 유대인들은 마소라 본문을 편찬하며 모음을 표기했지만, YHWH에 '주'(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모음을 첨가하여 읽는 사람이 '아도나이'로 읽도록 했다. 현대 성경 편집자들도 이를 따라 창조주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굵은 글씨로 'the LORD, 주님'으로 바꾸기도 한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를 뜻하는 '할렐루'와 '야훼'의 축약형인 '야'의 합성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는 의미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야 또는 -야후로 끝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 발음에 가깝다고 추정한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jave/Ιαβε}}라는 표기가 발견되는데, 당시 발음법에 따르면 {{IPA-allel라고 읽을 수 있다.
로마자로는 YHWH, YHVH, JHWH, JHVH 등으로 표기하며, 독일에서는 JHWH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4문자 YHWH로 쓰여진 하느님의 고유 이름으로, 정확한 실제 발음은 밝혀져 있지 않아 논쟁의 대상이지만, 이 4글자 단어 자체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른다.[97]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 "엘로힘"으로 대체했다. 이 거룩한 이름은 발음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하게 여겨져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라는 낱말이나 '하쉠'(그 이름)[98]으로 불렸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이라 발음하는 대신, 본문에 써 있는 바대로 여호와란 발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르네상스 이후 일부 기독교 학자들에게 채택되었다.[99]
빌헬름 게제니우스(1786~1842)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과 신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를 가장 사실적인 발음으로 제안했으며 사마리아 전통에 이 이름의 발음을 보고하였다.[100] 그 결과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성경 학계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99]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을 표기하지 않았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어근과 모음으로 표시되는 어형 변화를 통해 문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음 복원은 독자의 어휘에 달려 있었다. 이 방식을 아브자드(Abjad)라고 하며, 현대 아랍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성서 히브리어가 일상 언어로서 사어가 되면서 성스러운 네 글자(테트라그람마톤)의 정확한 발음은 사라졌다. [#사라진 경위](#사라진_경위)에서 후술하겠지만, 그 발음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이후 니크다(Niqqud) 또는 니쿠드라는 점을 찍어 모음을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야훼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아도나이("나의 주", #[사라진 경위](#사라진_경위)에서 후술)로 읽어왔다.[28]
야훼(의 자음 문자) "יהוה"에 아도나이(אֲדֹנָי)와 같은 니쿠드, 즉 "-ă -ō -a"라는 모음을 나타내는 점들을 찍어 예호와(יְהֹוָה, YəHōVaH)라고 읽게 되었다(문법적으로 헤브라이어 y에는 약모음 "ă(아)"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애매 모음인 슈워(ə)로 변한다).
일본어의 에호바(ヱ호바), 영어의 "Jehovah", 그리고 각 언어의 유사한 형태는 여기서 유래한다.
학술적으로는 야훼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다른 의견도 있음[48]), 확률적으로 정확한 발음과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본어에서는 야훼 외에도 야하베(YaHVeH)(헤브라이어 ו[w]는 현대 헤브라이어 발음으로 /v/로 발음), 야웨(YaHWe)(H의 aH를 장음으로 음사) 등의 표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인명 등의 고유 명사의 요소로 사용되는 יהוה의 약칭은 "야"(יָה ),"야후"(יָהוּ ) 등이며, 여기서 첫 번째 모음은 a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고대 교부에 의한 그리스 문자 전사 형태로 Ιαουε(이아오웨)[49], Ιαβε(이아베)[50]가 있으며, 이들로부터 YHWH의 원래 발음은 영어식으로 표기하는 "Yahweh" 또는 "Yahveh"였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고대부터 야훼(YHWH)의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어근(√היה (√hyh))과 관련지어 해석되어 왔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야훼가 모세에게 응답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אני הוה אני)라고 자칭한 데서 유래한다.
이 “나는 있다”(אני הוה (’ehyeh))라는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 미완료 시상 형태인 “그는 있다”로 하면 הוא הוה (yihyeh)가 되며, הואיה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 여기서 야훼의 이름은 이히예의 변형으로 “출애굽기에 나온 한마디”, “그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실존하는 것”, “분명히 눈앞에 있고, 존재하는 것” 등의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히브리인들은 맹세할 때 “주는 살아 계시다”라는 관용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도 그들이 야훼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생생하게 실존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서두에 따라 유대인( 그리스도교인, 무슬림)은 어둠이 주요 요소가 되는 우주를 건설한 존재를 야훼(하느님, 알라)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엘로힘(אלהים)은 알라하얌(알라)으로도 읽을 수 있다. 또한, 히브리어로는 이집트의 태양신을 엘(אל)로 표기한다.[55]
또한, הוה의 히필(使役) 태 3인칭 단수 남성 미완료 형태가 יהוה (yahyeh)가 되어, 마침 “야훼”와 같은 모음 조합이 된다. 여기서 그 이름을 “존재하게 하는 자”, “창조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발음 단원에서 설명했듯이, 오늘날 추정되는 발음 중 하나이다. 중자와 고주에 의한 구약성서[56]에서는 '하'를 소문자로 표기한 야훼가 사용되고 있다.
#발음 단원에서 설명했듯이, 오늘날 추정되는 발음 중 하나이다. 성서 연구가 활발한 영어권에서는 "Yahweh"를 일반적으로 “야훼”[57]라고 발음한다.
가톨릭의 『프란치스코회역 성서』에서 사용하는 발음이다.
주에서 전술했듯이, 『새번역』에서는 이 신을 거의 일관되게 “주”라고 부르고, 『창세기』 22장 14절에서만 “야훼”라고 한다. 이는 이른바 이삭의 번제가 행해진 “야훼·이레” 지명을 설명하기 위해 발음을 제시한 것이다.
참고로, 이 부분은 퍼블릭 도메인이 된 다른 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개역개정}}
|개역한글}}
|프란치스코회역 성서}}
일본어의 전통적인 형태로 사용되었다. 『메이지 원역 성서』와 함께 보급되어 일본의 사상과 문학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58].
『메이지 원역 성서』는 헤본 등에 의해 1887년에 완성되었으며, 구약성서 부분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도 신세계역 성서를 사용하게 될 때까지 이 단어가 등장하는 이 번역을 사용해 왔다.
시즈오카현후지노미야시후모토에는 일본 여호와교단이라는 문부과학대신 관할 포괄 종교법인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59].
역사적 가나다 표기로 쓰인 ヱホバ를 전후, 현대 가나다 표기로 바꾼 것.
“에호바” 또는 “ヱ호바”라는 읽기(표기)는 일본 문학에서도 예로부터 애용되어 왔다. 예로서 가톨릭 하이쿠 시인 아와노 세이보의 하이쿠가 있다. 참고로, 전술한 구의 저본은 그의 제자인 일본 예수 그리스도 교단 [http://hitomaru-church.com/ 아카시 히토마루 교회]의 프로테스탄트 하이쿠 시인 야마다 미노루의 웹사이트 [http://www.gospel-haiku.com/hl/kanshyo.htm#i1 수려한 구 감상] 페이지를 참고했지만, 이 구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도 있으며, 동일 사이트 [http://www.gospel-haiku.com/wwwforum/wwwforum.cgi?id=16&az=thread&number=64 세이보 하이쿠 연구] 페이지에서는 후자의 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 중에는 신의 이름이 사용된 번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히브리어 학 교수 엘리아스 훽터는 12개 언어(히브리어, 그리스어, 시리아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덴마크어, 보헤미아어, 폴란드어)를 대조한 뉘른베르크 다국어 대조 성경[60]을 만들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 란에 신의 이름 יהוה를 200회 이상 사용했다. 이 성경은 그 이후 성서 학자들의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1864년에 허먼 하인페터는 「신약 성경」을 출판하여 신약 성경에서 신의 이름을 “Jehovah”(에호바)로 번역하여 100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120개 이상의 언어로 신약 성경에서 신의 이름이 사용된 성경이 출판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의 번역에 의한 『신세계역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일반적인 신약 성경)에서도 “에호바”를 사용하고 있다. 신약의 그러한 번역 방식에 대해 “신의 이름을 복원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번역 방식을 지지하는 여러 자료”를 들고 있다[61]. 한편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는 신뢰할 수 있는 교정 본문이나 고대 번역, 교부 문서에도 신의 이름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세계역』의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5개 조항으로 정리하여 보이고, 신약에서 “에호바로 번역한 것, 이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62].
일본에서 여호와의 증인과 기원을 같이 하는 등대사(燈臺社) 회원은 전시 중, 아카시 준조 주간의 번역에 의해 “여호와의 증거자”라고 불렸다. 그리고 전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름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2. 3. 신성성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으로 인해 야훼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이 신성하므로 함부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발음은 잊혀지고 문자로만 표기하게 되었다.중세 시대에 마소라 학자들은 통일된 발음의 성경을 편찬하면서 모음을 표시했지만, 야훼에 대응되는 모음 대신 '주'(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모음을 첨가했다. 이는 십계명을 잘못 해석한 결과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색한 발음의 단어를 읽을 때, 독자들은 창조주의 이름이 적힌 곳을 '아도나이'(주)로 읽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현대 성경 편집자들도 야훼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굵은 글씨로 'the LORD, 주님'으로 바꾸기도 한다.
할렐루야는 ‘찬양하다’를 뜻하는 ‘할렐루’와 ‘야훼’의 축약형인 ‘야’의 합성어로, ‘야훼를 찬양하라’라는 의미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이 -야 또는 -야후로 끝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이 원래 하느님의 이름 발음에 가깝다고 추정된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Ιαβεel라는 표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4개의 자음 YHWH로 쓰인 하느님의 고유 이름이며, 정확한 발음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4글자 단어 자체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불린다.[97] 유대인들은 그리스-로마 시대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 "엘로힘"으로 대체했다. 야훼는 발음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하게 여겨져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나 '하쉠'(그 이름)[98], 또는 '솀 하메포라쉬'(거룩한 이름)로 불렸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이라 발음하는 대신, 본문에 써 있는 바대로 여호와란 발음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발음은 르네상스 이후 일부 기독교 학자들에게 채택되었다.[99]
빌헬름 게제니우스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과 신명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를 가장 사실적인 발음으로 제안했다.[100]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성경 학계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99]
유대인들은 영창 시에도 야훼 대신 아도나이(אֲדֹנָי)로 바꿔 읽는 등 야훼(יהוה)의 이름 발음을 피해 왔다. 현재도 유대인들은 야훼를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אֲדֹנָי) 또는 하셰엠(הַשֵּׁם, Hašem) 등으로 부른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 중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구절 때문에 신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하는 해석이 생겨났다. 이는 본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야훼의 이름을 연호하여 주문으로 삼거나, 야훼의 이름을 입에 대고 맹세한 후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며, 이름의 발음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남유다 왕국 붕괴부터 바빌론 포로 시대까지 쓰여진 『라키시 서간』에는 יהוהhe가 자주 나타나, 이 시대까지도 야훼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에 공공장소에서 야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기 시작했고,[51] 대신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아도나이(אֲדֹנָי, "나의 주")라는 단어로 바꾸기 시작했다. 로마 시대 예루살렘 포위전과 성전 파괴 이후인 서기 70년에 신의 이름의 원래 발음은 완전히 잊혀졌다.[51]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도 야훼라는 이름 대신 "하늘 아버지" 등으로 표현했다는 설이 있다.
기원전 3세기 초부터 번역이 시작된 『칠십인역 성서』에서는 히브리어의 "יהוהhe (야훼)"가 대부분의 구절에서 "주"를 의미하는 "Κύριοςel (퀴리오스)"로 번역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40년대에 발견된 기원전 1세기의 파피루스 파드 266호에는 신의 이름이 히브리어의 오래된 정방형 문자로 쓰여 있었다.
또한, 사해 사본의 일부인 기원전 1세기의 레위기 26장의 그리스어 단편 4Q120에는 신의 이름이 그리스어 형태로 ιαω(이아오)로 음역되어 있다.
1961년 나할 헤베르에서 발견된 1세기의 칠십인역 사본 단편인 칠십인역 VTS10a와 칠십인역 VTS10b, 칠십인역 IEJ12에도 고대 히브리어로 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52].
이집트 옥시린쿠스에서 발견된 P3522 단편은 1세기의 것으로, 욥기 42장 11, 12절이 기록되어 있으며, 거기에 신의 이름이 고대 히브리 문자로 쓰여 있었다. 이러한 최고(最古)의 사본 단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폴 E. 카일 박사는 "그리스도교 시대 이전의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에 의해 번역된 그리스어 성서 모두는, 신의 이름으로 히브리어 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53]. 신약 신학 신국제 사전은 "본문에 관한 최근의 발견은, 칠십인역 편찬자들이 사문자어 YHWH를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칠십인역의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사문자어가 그리스어 본문 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관습은 구약을 번역한 후대의 유대인 번역자들에 의해 1세기에 계승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54].
3. 야훼와 테트라그람마톤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YHWH로 표기되는 하느님의 고유 이름이며, 이 네 글자를 테트라그람마톤이라 부른다.[97]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이름이 너무나 신성하여 직접 발음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인 "엘로힘"으로 대체하여 불렀다.[97] 또한,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나 '하쉠'(그 이름)[98], '솀 하메포라쉬'(거룩한 이름) 등으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활동한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 대신 본문에 쓰인 대로 여호와라고 발음했는데, 이 발음은 르네상스 이후 일부 기독교 학자들에게 수용되었다.[99]
19세기에 히브리 학자 빌헬름 게제니우스(1786~1842)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과 신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가 가장 실제 발음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사마리아 전통에서 전해지는 발음을 참고했다.[100]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성경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기가 되었다.[99]
구약성서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יהוה(야훼)"라는 이름이 6,859회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이 네 글자의 히브리어 문자는 테트라그람마톤(Τετραγράμματον, 고대 그리스어로 "네 글자"라는 뜻)이라고 불리며, 아람 문자로 히브리어를 기록하게 된 후에도 이 네 글자는 페니키아 문자로 쓰였다고 한다.[47] 이들은 라틴 문자로 "YHVH", "YHWH", "JHVH", "JHWH", "IHVH" 등으로 표기된다.
『새번역성서』 부록에서는 "신의 이름인 YHWH의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야훼 또는 야하웨라고 표기된다. 이 신의 이름은 인명의 어미에 '야'라는 짧은 형태로 흔히 붙는다"고 설명한다.[46]
일반적으로 야훼라는 고유 명사는 신약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야훼의 축약형이 "할렐루야"의 형태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다.
3. 1. 테트라그람마톤의 유래
야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4문자 YHWH로 쓰여진 하느님의 고유 이름이며 정확한 실제 발음은 밝혀져 있지 않아 논란 거리에 있지만, 이 4글자 단어 자체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부른다.[97]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 "엘로힘"으로 대체하였다. 같은 시기에 이 거룩한 이름은 발음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신성하게 치부되었으며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라는 낱말이나 이를 가리킬 때 '하쉠'(그 이름)[98]으로 불렸다. 그 밖에도 거룩한 이름을 뜻하는 '솀 하메포라쉬'라고도 불렸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이라 발음하는 대신, 본문에 써 있는 바대로 여호와란 발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르네상스 이후 일부 그리스도교 학자들에게 채택되었다.[99]19세기에 히브리 학자 빌헬름 게제니우스 (1786~1842년)는 초기 그리스어 사본, 신명에 대한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를 가장 사실적인 발음으로 제안하였으며 사마리아 전통에 이 이름의 발음을 보고하였다.[100] 그 결과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성경 학계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다.[99]
3. 2. 종교적 금기
유대인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 "엘로힘"으로 대체했다.[97] 같은 시기에 이 이름은 너무 신성하게 여겨 발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님)나 '하쉠'(그 이름)[98], 또는 '솀 하메포라쉬'(거룩한 이름) 등으로 불렀다. 6세기에서 10세기에 마소라 학자들은 YHWH를 아도나이나 엘로힘 대신 본문에 쓰인 대로 여호와라고 발음했는데, 이 발음이 르네상스 이후 일부 기독교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99]빌헬름 게제니우스(1786~1842)는 19세기에 초기 그리스어 사본과 신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야훼"가 가장 사실적인 발음이라고 주장하며, 사마리아 전통에서 이 이름의 발음을 보고했다.[100] 19세기와 20세기에 성경 학자들은 야훼라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성경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되었다.[99]
4. 겐족 가설
야훼가 원래 미디안의 신이었다는 겐족 가설(:en:Kenites)은 야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다. 이 가설은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길라니(Friedrich Wilhelm Ghillany)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미디안의 연관성을 통해 히브리인들이 미디안 숭배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101][102][103] 모세가 이드로의 신 야훼를 이스라엘의 신 엘 샤다이와 동일시했다는 점도 겐족 가설의 근거로 제시된다.[101]
길라니는 1862년에 이 가설을 처음 제기했고, 1872년 네덜란드 종교 학자 코르넬리스 틸이 독립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독일의 비판적인 학자 베른하르트 슈타데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고, 독일 신학자 카를 부데에 의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104] 독일 셈족 학자 헤르만 구테, 게리트 빌데보어, 헨리 프레스콧 스미스, 조지 에런 바턴 등도 이 가설을 지지했다.[105] 물론, 이와는 다른 이론도 존재한다. 지역 부족 연합이 시나이에서 일신교 의식과 연결되었다는 주장도 있다.[106]
겐족 가설은 초기 여호와 문서(Yahwistic) 시를 통해 더욱 힘을 얻는다. 성경에는 야훼가 유다 왕국 남쪽 땅에 다섯 차례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신명기 33:2, 사사기 5:4, 하박국 3:3, 3:7, 이사야 63:1 등의 구절에서 야훼는 미디안과 에돔 땅, 보스라(:en:Bozrah), 세일 산, 바란 산, 데만 등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최근에는 블렌킨소프(Blenkinsopp, 2008)가 기존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이 가설은 관련 문학 및 고고학 데이터에 대해 현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테베스(Thebes, 2021)는 남부 레반트와 북부 아라비아의 성경 외적 증거에 주목하며, 가나안에 대한 "미디안"의 영향을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동안 진행된 문화 전승 과정으로 설명한다.[107]
4. 1. 가설의 내용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길라니가 제안한 겐족 가설에 따르면, 야훼는 역사적으로 미디안 신이었고, 모세의 장인과 미디안의 연관성은 히브리인들에 의한 미디안 숭배의 역사적 채택을 반영한다.[101][102][103] 모세는 이드로의 신 야훼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의 신 엘 샤다이와 동일시했다.[101] 가설은 히브리인들이 겐족을 통해 미디안인들에게서 야훼 숭배를 채택했다고 가정한다. 이 견해는 1862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길라니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1872년 네덜란드 종교 학자 코르넬리스 틸레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독일의 비판적인 학자 베른하르트 슈타데에 의해 더 완전히 제안되었고, 독일 신학자 카를 부데에 의해 더 완벽하게 정리되었다.[104] 독일 셈족 학자 헤르만 구테, Gerrit Wildeboer, H. P. 스미스, George Aaron Barton은 이 가설을 받아들였다.[105] 또 다른 이론은 지역 부족 연합이 시나이에서 일신교 의식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106]초기 여호와 문서는 겐족 가설을 뒷받침한다. 다섯 차례에 걸쳐 야훼는 성서에 나오는 유다 왕국 남쪽 땅에 명시적으로 거주한다. 이 구절은 신명기 33:2, 사사기 5:4, 하박국 3:3, 3:7, 이사야 63:1이다. 각 구절은 야훼가 미디안과 에돔 땅에서 나오신 것으로 묘사하며 때로는 보스라, 세일 산, 바란 산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때로는 신이 "남쪽"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인 데만에서 온 것으로 묘사된다.
최근 Blenkinsopp(2008)는 이용 가능한 증거를 재검토하여 "이 가설은 관련 문학 및 고고학 데이터에 대해 현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테베스(2021)는 남부 레반트와 북부 아라비아의 성경 외적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가나안에 대한 "미디안" 영향을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동안 진행된 문화 전승 과정으로 제시한다.[107]
4. 2. 학계의 평가
겐족 가설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길라니(Friedrich Wilhelm Ghillany)가 처음 제안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야훼는 원래 미디안의 신이었으며, 모세의 장인과 미디안의 연관성은 히브리인들이 미디안 숭배를 받아들인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101][102][103]. 모세는 이드로의 신 야훼를 이스라엘의 신 엘 샤다이와 동일시했다[101]. 즉, 히브리인들이 겐족을 통해 미디안인들에게서 야훼 숭배를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이러한 견해는 1862년 길라니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1872년 네덜란드 종교 학자 코르넬리스 틸에 의해 독립적으로 제안되었다. 이후 독일의 비판적인 학자 베른하르트 슈타데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고, 독일 신학자 카를 부데에 의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104]. 독일 셈족 학자 헤르만 구테, 게리트 빌데보어, 헨리 프레스콧 스미스, 조지 에런 바턴 등도 이 가설을 지지했다[105]. 이와는 다른 이론으로, 지역 부족 연합이 시나이에서 일신교 의식과 연결되었다는 주장도 있다[106].
초기 여호와 문서(Yahwistic) 시는 겐족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야훼는 성경에서 유다 왕국 남쪽 땅에 다섯 차례 명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신명기 33:2, 사사기 5:4, 하박국 3:3, 3:7, 이사야 63:1 등의 구절에서 야훼는 미디안과 에돔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며, 때로는 보스라(Bozrah), 세일 산, 바란 산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 때로는 "남쪽"을 의미하는 데만에서 오는 것으로 묘사된다.
최근에는 블렌킨소프(Blenkinsopp, 2008)가 기존 증거를 재검토하여 "이 가설은 관련 문학 및 고고학 데이터에 대해 현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설명을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 테베스(Thebes, 2021)는 남부 레반트와 북부 아라비아의 성경 외적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가나안에 대한 "미디안"의 영향을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동안 진행된 문화 전승 과정으로 제시한다[107].
5. 역사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는 야훼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를 '야훼교'라고도 한다. 하지만 야훼가 처음부터 숭배받던 신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원래 주신은 판테온의 우두머리인 엘이었으며,[1] 초기 이스라엘 지도자 중 '야훼'에서 기원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2] 야훼의 기원과 출현 배경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원래 이름이 '야훼'였는지조차 불확실하다.[3]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메르넵타 석비에 처음 등장했고, 야훼 숭배는 기원전 12세기에 그 존재가 확인된다.[4] 기원전 9세기 메사 석비가 제작될 때까지 야훼의 기원이나 성격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의 출현에 야훼 숭배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2] 겐족/미디안족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기원전 10세기부터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엘 신앙이 이스라엘 출현에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다.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작은 마을 규모였으나,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 왕국으로 발전했다.[2] 기원전 10세기 이후 부족 사회는 민족 국가로 대체되었고, 왕은 민족 종교의 교주이자 민족신의 지상 대리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에 즉위하는 의식을 주관했다.[6] 히브리어 성경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야훼 숭배의 중심지는 아니었다.[7] 초기 예배 장소로는 사마리아 언덕의 야외 제단, 단과 네게브 사막의 아랏과 브엘세바의 성전 등이 있었다.[4] 실로, 벧엘, 길갈, 미스바, 라마, 단 역시 중요한 장소였다.[8]
종교적 혼합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동일시했으며,[1] 출애굽기에 따르면 엘은 항상 야훼와 같은 신으로 여겨졌다.[1]
기원전 9세기 엘리야 선지자와 8세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야훼 숭배가 시작되었지만, 망명 이후에야 우위를 차지했다.[9] 이들은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일신숭배자들이었다.[10][11] 바빌론 유수 시기에 야훼의 추종자들은 야훼 이외의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며 유일신교로 나아갔다.[12] 일부 학자들은 널리 퍼진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보고 신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한다.[13][14][9]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함락시키면서 바빌론 유수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유다에 살지 않았지만,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인"이었다.[2]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주였으며, 바빌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권위를 얻었다. 그들이 옛 "야훼" 운동의 후예를 대표했지만, 그들이 제정한 종교는 군주제 시대의 야훼교와는 달랐다.[2] 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성문법 중심의 성서 강조, 혼인 금지를 통한 순결 유지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유대교 발전의 다음 단계인 제2성전 유대교로 이어졌다.[2]
초기 철기 시대(기원전 1200~1000년)에는 가나안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언어나 물질 문화의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 이스라엘 문화는 가나안 문화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되며,[1] 초기 이스라엘 종교는 만신전의 지배자인 엘, 그의 배우자 아세라, 그리고 바알과 같은 가나안 신들을 포함했다.[1] 하지만 이스라엘 크놀은 이 시기 이스라엘에서 인간 형상의 조각상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초기부터 일신교적 경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17]
가장 초기의 성경 문헌에서 야훼는 폭풍의 신의 특징을 지니며,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에돔이나 시나이 사막에서 천군과 함께 진군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18]
{{poemquote|야훼여, 주께서 세이르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떨어졌나이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물을 뿌렸나이다.
산들이 야훼의 임재 앞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시나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임재 앞에서 흔들렸나이다.
...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습니다.
그들의 궤도에서 그들은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사사기 5:4–5, 20)}}
일부 학자들은 폭풍의 신 이미지가 바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19][20]
케닌 가설에 따르면 에돔 신 고스가 야훼와 동일한 신이었을 수도 있다.[21] 공통된 영토적 기원 외에도 야훼 숭배와 에돔의 고스 숭배 사이의 유사성은 공유된 연관성을 암시한다. 에돔 사람 도엑은 야훼를 숭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대인 성소에 익숙했던 것으로 묘사된다.[9]
암몬인(몰렉)과 모압인(케모시)의 수장 신과 달리, 타나크는 에돔의 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22][23] 일부 학자들은 야훼와 고스의 유사성이 후자의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4] 다른 학자들은 야훼와 고스가 기원부터 다른 신이었으며, 제2 성전 시대 동안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의 긴장이 성경에서 고스의 생략의 배경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5]
일부 학자들은 야훼가 원래 신명기 32:8-9에서 엘의 아들 중 하나로 묘사되었으나, 후대에 텍스트가 수정되면서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21]
{{시 구절|text=지극히 높으신 분이 여러 나라에게 그들의 상속지를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
그분은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늘 군대의 수에 따라.
주님의 할당은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의 특별한 소유이다.
(신명기 32:8-9)}}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문맥 분석을 통해 엘 엘리온("지극히 높으신 분")과 야훼가 동일한 신에 대한 신명이라고 주장한다.[26][27]
후기 철기 시대에는 특정 국가 신과 관련된 국가의 등장을 보았다.[28] 케모시는 모압 사람들의 신이었고, 밀콤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고, 꼬스는 에돔 사람들의 신이었고,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었다.[18][7] 각 왕국에서 왕은 국가 종교의 수장이자 국가 신의 지상 대리인이었다. 야훼는 기원전 10세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왕국(사마리아)에서 국가 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1세기 후에 등장했을 수도 있는 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29]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 특히 이세벨과의 결혼 이후, 바알은 잠시 이스라엘(유다는 아님)의 국가 신을 대체했을 수 있다.[30][31]
기원전 9세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과 관련된 바알 숭배의 거부 징후가 나타났다. 따라서 야훼 종교는 가나안 유산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기원전 800년부터 500년까지 아세라, 태양 숭배 및 높은 곳에서의 숭배, 그리고 죽은 자와 관련된 관습과 옛 종교의 다른 측면에 대한 법적 및 예언적인 비난과 함께 계속되었다.[32] 바알, 엘, 아세라의 특징이 야훼에게 흡수되었고, 엘 샤다이와 같은 칭호는 야훼에게만 적용되었다.[3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훼만을 숭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더 큰 신들의 집단 내에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34] 야훼만을 섬기는 무리, 즉 선지자들과 신명기 저자들의 무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했고, 그들의 승리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시대와 야훼에 대한 충실함의 시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이스라엘의 성경적 서술의 배경이 되었다.[34]
일부 학자들은 광범위한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보고, 이것을 신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한다.[35][9] 엔게디에서 발견되어 기원전 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에서 야훼는 "여러 나라"의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히르벳 베이트 레이(라기시 근처)에서 발견된 다른 동시대 텍스트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통치자로 언급되어 있다.[36]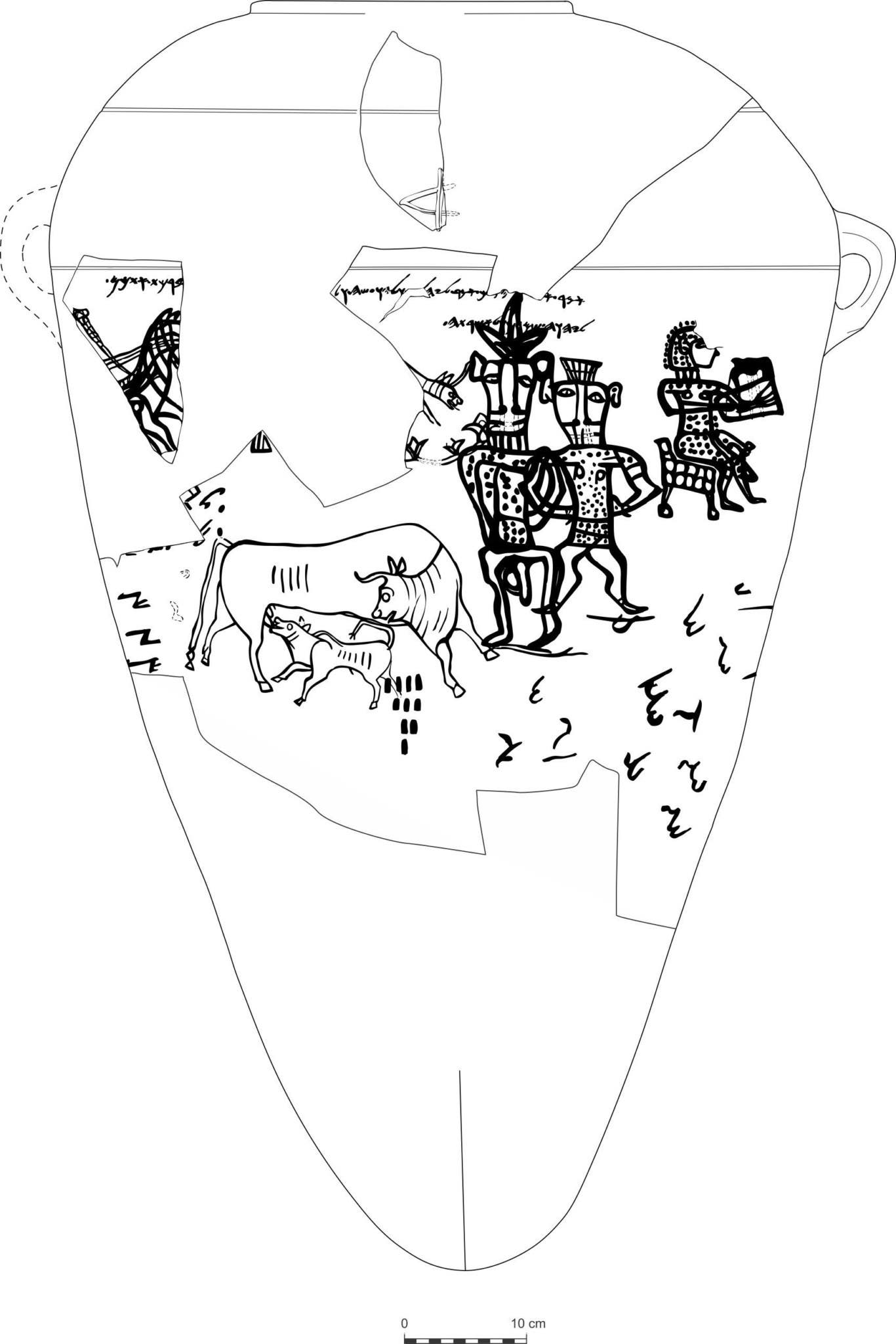
기원전 587/6년, 예루살렘은 신바빌로니아에 함락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지도자들은 유배되었다. 이후 50년간의 바빌론 유배 기간은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스라엘 외부에서는 야훼께 전통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에, 안식일 준수와 할례 등 다른 관습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제2이사야의 저술에서 야훼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약속을 확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페르시아 정복자 키루스 2세에게 함락되자, 유배자들은 귀환 허가를 받았고 (비록 소수만이 귀환했지만), 기원전 500년경에는 제2성전이 건립되었다.
제2성전 시대 말엽에는 공공장소에서 야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나의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אֲדֹנָיhe)라는 단어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성전에서 단 한 번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헬레니즘 시대 동안, 성경은 이집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테트라그램마톤과 ''아도나이'' 모두를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κύριοςel)로 번역한다.
페르시아 지배 시대에는 야훼의 대표자로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을 통치할 미래의 인간 왕,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발전하였다. 이를 처음 언급한 사람들은 초기 페르시아 시대의 예언자였던 학개와 즈가랴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서 보았는데, 그는 잠시나마 고대 왕가를 재건할 것처럼 보였다. 또는 스룹바벨과 최초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서 보았다 (즈가랴는 왕족 메시아와 제사장 메시아 두 명을 언급한다). 이러한 초기의 희망은 좌절되었고 (스룹바벨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대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 후로는 단순히 다윗의 메시아 (즉, 후손)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이 남았다.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나중에 제2성전 유대교가 등장하였고, 이로부터 기독교, 랍비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생겨났다.
필립 킹(Philip King)과 로렌스 스테이저(Lawrence Stager)는 야훼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후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1550년–기원전 1200년
- 철기 시대 I: 기원전 1200년–기원전 1000년
- 철기 시대 II: 기원전 1000년–기원전 586년
- 신바빌로니아 시대: 기원전 586년–기원전 539년
-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539년–기원전 332년[1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학술 용어로는 기원전 957년 예루살렘 성전 건립부터 기원전 586년 파괴까지의 제1성전 시대, 기원전 586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의 유배 시대, 그 이후 시대의 유배 후 시대, 그리고 기원전 515년 성전 재건부터 서기 70년 파괴까지의 제2성전 시대가 있다.
5. 1. 초기 이스라엘 종교
초기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은 야훼 숭배였으며, 이 때문에 '야훼교'라고도 불린다.[1]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에서 처음부터 숭배되던 신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주신은 판테온의 우두머리인 엘이었다.[2] 구약의 족장들, 이스라엘 지파들, 사사들, 또는 초기 군주들 중 어느 누구도 '야훼'에서 기원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3] 야훼가 레반트에서 어떻게, 어디서, 왜 출현했는지는 불분명하며, 원래 이름이 '야훼'인지도 확실치 않다.[4]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메르넵타 석비와 함께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했으며, 야훼 숭배는 기원전 12세기에 입증되었다.[5] 기원전 9세기에 메사 석비가 제작될 때까지 레반트 지역에서 야훼의 기원이나 성격, 이름에 대한 증거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1][6] 많은 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이 출현하는데 야훼에 대한 공동 숭배가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3] 겐족/미디안족과 이스라엘의 문화적 교류 흔적이 기원전 10세기부터 확인되면서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를 얻고 있다.[7] 엘 신앙이 이스라엘 출현에 더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더 보편적이다.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작은 마을 규모였으나, 도시 중심지가 성장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원전 9세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3] 기원전 10세기 이후 철기 시대의 부족들은 민족 국민 국가로 대체되었으며, 각 왕국의 왕은 민족 종교의 교주이자 민족신의 지상 부왕이었다.[1] 예루살렘에서 왕은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에 즉위하는 의식을 주관했다.[8] 히브리어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야훼의 중심 성전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스라엘 왕국이나 사마리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9] 가장 초기에 알려진 이스라엘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 언덕에 있는 12세기 야외 제단으로, 가나안 사람 "불-엘"(황소 모양의 엘)을 연상시키는 청동 황소와 고고학적 유적이 있다. 이스라엘 북쪽 경계의 단과 네게브 사막의 아랏과 브엘세바에서 더 많은 성전이 발견되었다.[5] 실로, 벧엘, 길갈, 미스바, 라마, 단은 축제, 제사, 서원, 개인 의식, 법적 분쟁의 판결을 위한 주요 장소였다.[10]
종교적 혼합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동일시했다.[11] 출애굽기 6:2–3에서 엘은 야훼와 같은 신으로 여겨졌다.[11]
오직 야훼에 대한 예배는 기원전 9세기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시작되었고 늦어도 8세기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망명과 망명 이후 초기에 우위를 차지하기 전까지 소규모 정당의 관심사로 남아 있었다.[12] 이 파벌의 초기 지지자들은 일신주의자로, 야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다.[13][14] 바빌론 유수라는 국가 위기 동안 야훼의 추종자들은 야훼 이외의 다른 신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유일신교로 전환했다.[15] 일부 학자들은 널리 퍼진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추정하고 이를 신아시리아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12][16][17]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함락시키고 바빌론 유수가 끝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유다에 살지 않았지만,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인"이었다.[3]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주였으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와 연결되어 귀환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그들이 옛 "야훼" 운동의 후예를 대표했지만 그들이 제정한 종교는 군주제 야훼교와는 상당히 달랐다.[3] 차이점에는 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성문법과 성서에 대한 새로운 초점, 통혼 금지를 통한 순결 보존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었다. 이 새로운 믿음은 유대교 발전의 다음 단계인 두 번째 성전 유대교를 나타낸다.[3]
필립 킹과 로렌스 스테이저는 야훼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후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1550년–기원전 1200년
- 철기 시대 I: 기원전 1200년–기원전 1000년
- 철기 시대 II: 기원전 1000년–기원전 586년
- 신바빌로니아 시대: 기원전 586년–기원전 539년
-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539년–기원전 332년
흔히 사용되는 다른 학술 용어로는, 기원전 957년 예루살렘 성전 건립부터 기원전 586년 파괴까지의 제1성전 시대, 기원전 586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의 유배 시대(신바빌로니아 시대와 동일), 그 이후 시대의 유배 후 시대, 그리고 기원전 515년 성전 재건부터 서기 70년 파괴까지의 제2성전 시대가 있다.
초기 철기 시대(기원전 1200~1000년)에는 가나안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언어나 물질 문화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문화를 가나안 문화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한다.[11]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 종교는 만신전의 지배자인 엘, 그의 배우자 아세라, 그리고 바알과 같은 가나안 신들을 포함했다.[11] 그러나 이스라엘 크놀은 이 시기 이스라엘에서 인간 형상의 조각상이나 종교적인 조각상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신교적 관행을 시사한다.[19]
가장 초기의 성경 문헌에서 야훼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 전형적인 폭풍의 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에돔이나 시나이 사막에서 별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천군과 함께 진군한다.[20]
혹은 폭풍의 신 이미지는 바알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21]
케닌 가설에 따르면, 에돔 신 고스가 야훼와 동일한 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22] 야훼 숭배와 에돔의 고스 숭배 사이의 여러 공통적인 특징들은 공유된 연관성을 암시한다. 에돔 사람 도엑은 야훼를 숭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대인 성소에 익숙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암몬인(밀콤)과 모압인(케모시)의 수장 신과 달리, 타나크는 에돔의 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생략이 야훼와 고스의 유사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3] 다른 학자들은 야훼와 고스가 기원부터 다른 신이었으며, 제2 성전 시대 동안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의 긴장이 성경에서 고스의 생략의 배경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4]
5. 2. 야훼 숭배의 발전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는 야훼 숭배가 있었으며, 이를 '야훼교'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야훼가 처음부터 숭배받던 신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원래 주신은 판테온의 우두머리인 엘이었으며,[1] 초기 이스라엘 지도자 중 '야훼'에서 기원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2] 야훼가 어디서, 왜 출현했는지는 불분명하며, 원래 이름이 '야훼'인지조차 확실치 않다.[3]"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메르넵타 석비에 처음 등장했고, 야훼 숭배는 기원전 12세기에 나타났다.[4] 기원전 9세기 메사 석비가 제작될 때까지 야훼의 기원이나 성격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5][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의 출현에 야훼 숭배가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2] 겐족/미디안족과의 문화적 교류를 통해 기원전 10세기부터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다. 엘 신앙이 이스라엘 출현에 더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작은 마을 규모였으나, 기원전 9세기에 이르러 이스라엘 왕국으로 발전했다.[2] 기원전 10세기 이후 부족 사회는 민족 국가로 대체되었고, 왕은 민족 종교의 교주이자 민족신의 지상 대리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에 즉위하는 의식을 주관했다.[6] 히브리어 성경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야훼 숭배의 중심지는 아니었다.[7] 초기 예배 장소로는 사마리아 언덕의 야외 제단, 단과 네게브 사막의 아랏과 브엘세바의 성전 등이 있었다.[4] 실로, 벧엘, 길갈, 미스바, 라마, 단 역시 중요한 장소였다.[8]
종교적 혼합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동일시했으며,[1] 출애굽기에 따르면 엘은 항상 야훼와 같은 신으로 여겨졌다.[1]
기원전 9세기 엘리야 선지자와 8세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야훼 숭배가 시작되었지만, 망명 이후에야 우위를 차지했다.[9] 이들은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일신숭배자들이었다.[10][11] 바빌론 유수 시기에 야훼의 추종자들은 야훼 이외의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며 유일신교로 나아갔다.[12] 일부 학자들은 널리 퍼진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보고 신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한다.[13][14][9]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함락시키면서 바빌론 유수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유다에 살지 않았지만,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인"이었다.[2]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주였으며, 바빌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권위를 얻었다. 그들이 옛 "야훼" 운동의 후예를 대표했지만, 그들이 제정한 종교는 군주제 시대의 야훼교와는 달랐다.[2] 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성문법 중심의 성서 강조, 혼인 금지를 통한 순결 유지가 중요해졌다. 이 새로운 믿음은 유대교 발전의 다음 단계인 제2성전 유대교를 나타낸다.[2]
필립 킹(Philip King)과 로렌스 스테이저(Lawrence Stager)는 야훼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후기 청동기 시대: 기원전 1550년–기원전 1200년
- 철기 시대 I: 기원전 1200년–기원전 1000년
- 철기 시대 II: 기원전 1000년–기원전 586년
- 신바빌로니아 시대: 기원전 586년–기원전 539년
- 페르시아 시대: 기원전 539년–기원전 332년[15]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학술 용어로는 기원전 957년 예루살렘 성전 건립부터 기원전 586년 파괴까지의 제1성전 시대, 기원전 586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의 유배 시대, 그 이후 시대의 유배 후 시대, 그리고 기원전 515년 성전 재건부터 서기 70년 파괴까지의 제2성전 시대가 있다.
초기 철기 시대(기원전 1200~1000년)에는 가나안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언어나 물질 문화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1] 이스라엘 문화는 가나안 문화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되며,[1] 이스라엘 종교는 만신전의 지배자인 엘, 그의 배우자 아세라, 그리고 바알과 같은 가나안 신들을 포함했다.[1] 그러나 이스라엘 크놀은 이 시기 이스라엘에서 인간 형상의 조각상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신교적 관행을 시사한다.[17]
가장 초기의 성경 문헌에서 야훼는 폭풍의 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에돔이나 시나이 사막에서 천군과 함께 진군한다.[18]
{{poemquote|야훼여, 주께서 세이르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떨어졌나이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물을 뿌렸나이다.
산들이 야훼의 임재 앞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시나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임재 앞에서 흔들렸나이다.
...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습니다.
그들의 궤도에서 그들은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사사기 5:4–5, 20)}}
일부 학자들은 폭풍의 신 이미지가 바알에서 유래했을 수 있다고 본다.[19][20]
케닌 가설에 따르면 에돔 신 고스가 야훼와 동일한 신이었을 수 있다.[21] 공통된 영토적 기원 외에도 야훼 숭배와 에돔의 고스 숭배 사이의 여러 공통적인 특징들은 공유된 연관성을 암시한다. 에돔 사람 도엑은 야훼를 숭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대인 성소에 익숙했던 것으로 묘사된다.[9]
암몬인(몰렉)과 모압인(케모시)의 수장 신과 달리, 타나크는 에돔의 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22][23] 일부 학자들은 야훼와 고스의 유사성이 후자의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4] 다른 학자들은 야훼와 고스가 기원부터 다른 신이었으며, 제2 성전 시대 동안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의 긴장이 성경에서 고스의 생략의 배경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5]
일부 학자들은 야훼가 원래 신명기 32:8-9에서 엘의 아들 중 하나로 묘사되었으나, 후대에 텍스트가 수정되면서 제거되었다고 주장한다.:[21]
{{시 구절|text=지극히 높으신 분이 여러 나라에게 그들의 상속지를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
그분은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늘 군대의 수에 따라.
주님의 할당은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의 특별한 소유이다.
(신명기 32:8-9)}}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문맥 분석을 통해 엘 엘리온("지극히 높으신 분")과 야훼가 동일한 신에 대한 신명이라고 주장한다.[26][27]
후기 철기 시대에는 특정 국가 신과 관련된 국가의 등장을 보았다.[28] 케모시는 모압 사람들의 신이었고, 밀콤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고, 꼬스는 에돔 사람들의 신이었고,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었다.[18][7] 각 왕국에서 왕은 국가 종교의 수장이자 국가 신의 지상 대리인이었다. 야훼는 기원전 10세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왕국(사마리아)에서 국가 신의 역할을 수행했고, 1세기 후에 등장했을 수도 있는 유다에서도 마찬가지였다.[29]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 특히 이세벨과의 결혼 이후, 바알은 잠시 이스라엘(유다는 아님)의 국가 신을 대체했을 수 있다.[30][31]
기원전 9세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과 관련된 바알 숭배의 거부 징후가 있다. 따라서 야훼 종교는 가나안 유산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기원전 800년부터 500년까지 아세라, 태양 숭배 및 높은 곳에서의 숭배, 그리고 죽은 자와 관련된 관습과 옛 종교의 다른 측면에 대한 법적 및 예언적인 비난과 함께 계속되었다.[32] 바알, 엘, 아세라의 특징이 야훼에게 흡수되었고, 엘 샤다이와 같은 칭호는 야훼에게만 적용되었다.[33]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훼만을 숭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더 큰 신들의 집단 내에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투쟁이 발생했다.[34] 야훼만을 섬기는 무리, 즉 선지자들과 신명기 저자들의 무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했고, 그들의 승리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시대와 야훼에 대한 충실함의 시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이스라엘의 성경적 서술의 배경이 되었다.[34]
일부 학자들은 광범위한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보고, 이것을 신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 본다.[35][9] 엔게디에서 발견되어 기원전 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에서 야훼는 "여러 나라"의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히르벳 베이트 레이(라기시 근처)에서 발견된 다른 동시대 텍스트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통치자로 언급되어 있다.[36]
5. 3. 바빌론 유수 이후
바빌론 유수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야훼의 추종자들은 야훼 이외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일신교로 나아갔고, 이는 야훼교에서 유대교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일부 학자들은 널리 퍼진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추정하고, 이를 신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보기도 한다.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함락되어 바빌론 유수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그들은 유다에 살지 않았지만, 성경 저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이었다.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주였고,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와 연결되어 귀환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그들이 옛 "야훼" 운동의 후예를 대표했지만, 그들이 제정한 종교는 군주제 야훼교와는 상당히 달랐다. 차이점으로는 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성문법과 이에 따른 성서에 대한 새로운 초점,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의 통혼을 금지함으로써 순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관심 등이 있었다. 이 새로운 믿음은 유대교 발전의 다음 단계인 제2성전 유대교를 나타낸다.
기원전 587/6년, 예루살렘은 신바빌로니아에 함락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지도자들은 유배되었다. 이후 50년간의 바빌론 유배 기간은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스라엘 외부에서는 야훼께 전통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에, 안식일 준수와 할례 등 다른 관습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제2이사야의 저술에서 야훼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약속을 확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페르시아 정복자 키루스 2세에게 함락되자, 유배자들은 귀환 허가를 받았고 (비록 소수만이 귀환했지만), 기원전 500년경에는 제2성전이 건립되었다.
제2성전 시대 말엽에는 공공장소에서 야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성경을 낭독할 때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나의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אֲדֹנָיhe)라는 단어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성전에서 단 한 번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헬레니즘 시대 동안, 성경은 이집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테트라그램마톤과 ''아도나이'' 모두를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κύριοςel)로 번역한다.
페르시아 지배 시대에는 야훼의 대표자로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을 통치할 미래의 인간 왕,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발전하였다. 이를 처음 언급한 사람들은 초기 페르시아 시대의 예언자였던 학개와 즈가랴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서 보았는데, 그는 잠시나마 고대 왕가를 재건할 것처럼 보였다. 또는 스룹바벨과 최초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서 보았다 (즈가랴는 왕족 메시아와 제사장 메시아 두 명을 언급한다). 이러한 초기의 희망은 좌절되었고 (스룹바벨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대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 후로는 단순히 다윗의 메시아 (즉, 후손)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이 남았다.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나중에 제2성전 유대교가 등장하였고, 이로부터 기독교, 랍비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생겨났다.
6. 신앙과 실천
야훼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 숭배와 그에 따른 실천적 삶에 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야훼를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십계명을 비롯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근본으로 여겼다. 십계명은 야훼 신앙의 핵심 가치인 정의, 공의, 사랑을 반영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지침이 되었다.
야훼 숭배는 성전에서의 제사, 절기 준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실천을 통해 나타났다.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제사장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렸다. 절기는 야훼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야훼 신앙의 중요한 실천 요소였다. 선지자들은 불의와 부정부패를 비판하며, 야훼의 공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사회의 개혁을 이끌고, 야훼 신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6. 1. 만신전
현대 학자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가 기본적으로 다신교였으며, 여러 남신과 여신이 숭배되었다는 데 광범위하게 동의한다.[1] 주신은 기원전 8세기 후반에서 6세기까지 인감의 요소로 이름이 등장하는 야훼였다.[2] 야훼의 배우자로는 아세라가 있었으며,[2] 엘레판티네섬(이집트의 5세기 유대인 정착지)의 사원에서는 여신 "아나트-야후"로 대체되었다.[3] 구약성경은 예루살렘, 벧엘, 사마리아의 야훼 성전에 아세라 여신의 동상이 함께 모셔졌다고 전한다.[4][5]
야훼와 아세라 아래에는 바알, 샤마 시, 야리크, 모트, 아스타르테와 같은 2계층 신과 여신들이 있었고, 이들은 각자 제사장과 예언자를 두었으며 왕족 중에도 신봉자가 있었다.[6][4]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신도 숭배되었는데, 이는 아스타르테와 메소포타미아 여신 이슈타르가 융합된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5]
3계층은 뱀 물림 치료의 신과 같은 전문 신들로 구성되었을 수 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 본문에서 묘사된 형태와 만들어진 금속에 근거한 말장난인 '네후쉬탄'으로 식별된다.[6] 이들 아래에는 더 높은 신들의 전령인 알락이 있었는데, 이들은 후대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천사, 그리고 케루빔과 같은 다른 천상의 천사가 되었다.
바알과 야훼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공존했지만, 기원전 9세기 이후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민족신의 지위로 높이려 하자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7] 바알 숭배는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7]
현재 학계에서는 초기 철기 시대(기원전 1200~1000년)에 가나안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언어나 물질 문화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문화를 가나안 문화의 하위 집합으로 정의한다.[7]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스라엘 종교는 만신전의 지배자인 엘,[8] 그의 배우자 아세라, 바알과 같은 가나안 신들을 포함했다.[7] 그러나 이스라엘 크놀은 이 시기 이스라엘에서 인간 형상의 조각상이나 종교적인 조각상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신교적 관행을 시사한다.[9]
가장 초기의 성경 문헌에서 야훼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 전형적인 폭풍의 신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에돔이나 시나이 사막에서 별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천군과 함께 진군한다.[10]
{{poemquote|야훼여, 주께서 세이르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떨어졌나이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물을 뿌렸나이다.
산들이 야훼의 임재 앞에서 흔들리고,
심지어 시나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임재 앞에서 흔들렸나이다.
...
하늘에서 별들이 싸웠습니다.
그들의 궤도에서 그들은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사사기 5:4–5, 20, ''WEB'' 세계 영어 성경, 드보라의 노래.)}}
폭풍의 신 이미지는 바알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8]
케닌 가설에 따르면 에돔 신 고스가 야훼와 동일한 신이었을 수 있으며, 고스라는 이름이 야훼의 칭호였을 가능성도 있다.[11] 공통된 영토적 기원 외에도 야훼 숭배와 에돔의 고스 숭배 사이의 여러 공통적인 특징들은 공유된 연관성을 암시한다. 에돔 사람 도엑은 야훼를 숭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유대인 성소에 익숙했던 것으로 묘사된다.[12]
암몬인(밀콤)과 모압인(케모시)의 수장 신과는 달리, 타나크는 에돔의 고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13][14]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생략이 야훼와 고스의 유사성 때문에 후자의 거부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5] 다른 학자들은 야훼와 고스가 기원부터 다른 신이었으며, 제2 성전 시대 동안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의 긴장이 성경에서 고스의 생략의 배경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6]
야훼가 원래 신명기 32:8-9에서 엘의 아들 중 하나로 묘사되었으며, 후대에 텍스트를 수정하면서 제거되었다는 주장이 있다.[17]
{{시 구절|text=지극히 높으신 분이 여러 나라에게 그들의 상속지를 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
그분은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늘 군대의 수에 따라.
주님의 할당은 그의 백성이며,
야곱은 그의 특별한 소유이다.
(신명기 32:8-9, 새 영어 번역, 모세의 노래)}}
일부 학자들은 문맥 분석에 기초하여 엘 엘리온("지극히 높으신 분")과 야훼가 동일한 신에 대한 신명이라고 주장한다.[18][19]
후기 철기 시대에는 특정 국가 신과 관련된 국가의 등장을 보았다.[20] 케모시는 모압 사람들의 신이었고, 밀콤은 암몬 사람들의 신이었고, 꼬스는 에돔 사람들의 신이었고, 야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었다.[21][22] 각 왕국에서 왕은 국가 종교의 수장이자 국가 신의 지상 대리인이었다.[23] 야훼는 기원전 10세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왕국(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세기 후에 등장했을 수도 있는 유다에서 국가 신의 역할을 수행했다.[24] (성경 어디에도 "유다의 신"이라는 언급은 없다).[21][22]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 특히 이세벨과의 결혼 이후 바알은 잠시 이스라엘(유다는 제외)의 국가 신을 대체했을 수 있다.[25][26]
기원전 9세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과 관련된 바알 숭배의 거부 징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야훼 종교는 가나안 유산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기원전 800년부터 500년까지 아세라, 태양 숭배, 높은 곳에서의 숭배, 죽은 자와 관련된 관습과 옛 종교의 다른 측면에 대한 법적, 예언적인 비난과 함께 계속되었다.[27] 바알, 엘, 아세라의 특징이 야훼에게 흡수되었고, 엘 샤다이와 같은 칭호는 야훼에게만 적용되었다.[28]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야훼만을 숭배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더 큰 신들의 집단 내에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투쟁이 발생했다.[29] 야훼만을 섬기는 무리, 즉 선지자들과 신명기 저자들의 무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했고, 그들의 승리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시대와 야훼에 대한 충실함의 시대 사이에서 동요하는 이스라엘의 성경적 서술의 배경이 되었다.[29]
일부 학자들은 광범위한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보고, 이를 신아시리아의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한다.[30][31] 엔게디에서 발견되어 기원전 7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문에서 야훼는 "여러 나라"의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히르벳 베이트 레이(라기시 근처)에서 발견된 다른 동시대 텍스트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통치자로 언급되어 있다.[32]
6. 2. 숭배
야훼교에서는 축제, 희생, 서원, 사적인 의식, 법적 분쟁의 판결 등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는 당시 다른 셈족 종교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이다. 야훼 숭배의 중심은 시골 생활의 주요 사건과 일치하는 3개의 큰 연례 축제, 즉 어린 양의 탄생제인 유월절, 곡식 수확제인 칠칠절, 과일 수확제인 초막절에 있다.[1]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화에 나오는 사건들과 관련이 있게 되었다. 유월절은 이집트 탈출, 칠칠절은 시나이에서 율법을 준 사건, 초막절은 광야 방랑이었다.[2] 이와 같이 축제들은 비록 초기의 농업적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야훼의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기념했다.[3]동물 공희는 야훼교와 유대교(서기 70년 제2성전 이 파괴되기 전)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제사를 지낸 후 제단을 태우고 피를 뿌리는데, 이는 성경에서 매일의 성전 의식으로 묘사된 유대인의 관습이다. 희생은 아마도 노래나 시편 낭송으로 보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부 사항은 부족하다.[4] 레위기 1-16장에 자세히 설명된 의식은 순결과 속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실제로 바벨론 포로와 야훼교/유대교 전환 후에만 따랐다. 사실, 가장이라면 누구라도 경우에 따라 희생을 바칠 수 있었다.[4]
야훼 숭배의 중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연례 축제가 있었는데, 이는 농촌 생활의 주요 사건과 일치했다. 유월절은 양의 출산과, 칠칠절은 곡물 수확과, 초막절은 과일 수확과 일치했다.[5] 이러한 축제들은 야훼 종교의 도래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5] 그러나 이 축제들은 이스라엘의 국가 신화와 연결되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의 출애굽과, 칠칠절은 시나이 산에서의 율법 수여와, 초막절은 광야 방황과 연결되었다.[6] 따라서 이 축제들은 야훼의 이스라엘 구원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기념했지만, 초기 농업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7] 야훼 숭배에는 희생 제사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1-16장에 자세히 설명된 의식, 즉 순결과 속죄에 대한 강조는 바빌론 유수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실제로는 가족의 가장이 필요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8] 많은 학자들은 또한 갓난아이 제사, 지하 세계 신 몰렉에게든 야훼 자신에게든, 기원전 7세기 후반 요시야 왕의 개혁 이전까지 이스라엘/유다 종교의 일부였다고 결론지었다.[9] 제사는 시편의 노래나 낭송으로 보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부 사항은 부족하다.[10] 기도는 공식적인 예배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11]
6. 3. 선지자와 영웅
희생 제사장들 외에도 선지자와 영웅이 야훼교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나중에는 유대교에서도 삼손과 여호수아에 관한 전설이 현대 유대 문서에 반영되어 선지자와 서사시 영웅이 활약했다. 모리아산 / 시온산(성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게리짐산에 사마리아인의 성전이 있는 문자 그대로 높은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 부적과 신비한 테라핌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야훼교가 대중화되었을 때 황홀한 제의 의식(성약의 궤 앞에서 벌거벗은 춤을 추는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인신공양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7. 야훼와 일신교의 등장
이스라엘 민족이 일신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야훼교'의 형성과 발전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초기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은 야훼 숭배였으나, 야훼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서 숭배되던 신은 아니었다.[108] 원래 이스라엘의 주신은 엘이었으며, 야훼의 기원과 출현 배경은 불분명하다.[109]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메르넵타 비석에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반면, 야훼 숭배는 기원전 12세기에 처음 나타났다. 이후 기원전 9세기 메사 석비에서 야훼의 이름이 확인된다. 많은 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에 야훼 숭배가 이스라엘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겐족/미디안족과의 교류를 통해 야훼 신앙이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존재한다. 엘 신앙 역시 이스라엘 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작은 마을 규모였으나, 점차 도시 중심지가 성장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 왕은 민족 종교의 교주로서 민족신의 지상 부왕 역할을 했다.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훼 즉위 의식을 주관했다. 히브리어 성경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이 야훼의 유일한 성전은 아니었으며, 사마리아 언덕의 야외 제단, 단, 네게브 사막의 아랏과 브엘세바 등에서도 야훼를 숭배했다. 실로, 벧엘, 길갈, 미스바, 라마, 단 역시 종교적 중심지였다.
종교적 혼합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동일시했으며, 출애굽기에서는 엘이 야훼와 같은 신으로 여겨졌다.
기원전 9세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야훼에 대한 예배가 시작되었고, 기원전 8세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야훼와 바알 사이의 분쟁이 나타났다. 초기에는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일신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바빌론 유수 시기에 야훼의 추종자들은 야훼 외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일신교로 나아갔다. 일부 학자들은 기원전 8세기 신아시리아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일신교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함락되면서 바빌론 유수가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유다에서 권위를 얻었으며, 이들이 제정한 종교는 군주제 야훼교와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성문법 중심의 성서에 대한 강조, 통혼 금지 등을 통해 순결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유대교 발전의 다음 단계인 두 번째 성전 유대교를 나타낸다. 야훼만을 숭배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야훼를 "땅을 축복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주요 신으로 묘사했다.
현대 신학에서는 야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유대교 및 기독교 신학에서는 야훼를 전능하고 초월적인 신으로 묘사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야훼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해방신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야훼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정신학은 야훼를 변화하는 세계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야훼를 여성적인 면모를 지닌 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며,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7. 1. 일신숭배에서 일신교로
대부분의 군주제 기간 동안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은 야훼라는 신에 대한 숭배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야훼교'라 불린다.[1]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에서 처음부터 숭배되던 신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스라엘의 원래 주신은 판테온의 우두머리인 엘이며,[2] 구약의 족장들, 이스라엘 지파들, 사사들, 또는 초기 군주들 중 어느 누구도 '야훼'에서 기원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3] 야훼가 레반트에서 어떻게, 어디서, 왜 출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원래 이름이 '야훼'인지도 확실치 않다.[4]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기원전 13세기 이집트의 메르넵타 석비와 함께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반면, 야훼 숭배는 기원전 12세기에 정황적으로나마 입증되었다.[5] 약 400년 후인 기원전 9세기에 메사 석비가 제작될 때까지 레반트 지역에서 야훼의 기원이나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야훼의 이름에 대한 증거나 기록도 발견된 바가 없다.[1]There is at least one candidate for an even earlier attestation of Yahweh's name: the Gezer calendar, commonly dated to the 10th century BCE,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이 출현하는데 야훼에 대한 공동 숭배가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3] 하지만, 야훼 신앙을 이스라엘에 전파했으리라고 여겨지는 겐족/미디안족과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문화적 교류와 접촉의 흔적이 기원전 10세기부터 확인되기에 기원전 10세기부터 야훼 신앙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109] 야훼 신앙 보다는 엘 신앙이 이스라엘이 출현하는데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더 보편적인 견해이다.
당시 초기 이스라엘 사회는 작은 마을 규모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 중심지가 성장하고 사회가 더욱 체계화되고 복잡해졌으며, 기원전 9세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워졌다.[3] 기원전 10세기 이후 철기 시대의 부족과 추장들은 민족 국민 국가로 대체되었다. 각 왕국에서 왕은 또한 민족종교의 교주였으며 따라서 민족신의 지상 부왕이었다.[1] 예루살렘 에서 이것은 왕이 야훼가 예루살렘 성전에 즉위하는 의식을 주관할 때 매년 반영되었다.[6] 히브리어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야훼의 중심, 또는 심지어 유일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주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스라엘 왕국이나 사마리아의 주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 가장 초기에 알려진 이스라엘 예배 장소는 사마리아 언덕에 있는 12세기 야외 제단으로 가나안 사람 "불-엘"(황소 모양의 엘)을 연상시키는 청동 황소와 고고학적 유적이 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단과, 한때 유다의 일부였던 네게브 사막의 아랏과 브엘세바에서 더 많은 성전이 발견되었다.[8] 실로, 벧엘, 길갈, 미스바, 라마, 단은 또한 축제, 제사, 서원, 개인 의식, 법적 분쟁의 판결을 위한 주요 장소였다.[9]
종교적 혼합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동일시하였다.[11] 이후 엘은 출애굽기 6:2–3에서 알 수 있듯이 항상 야훼와 같은 신으로 여겨졌다.[11]
오직 야훼에 대한 예배는 기원전 9세기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시작되었고 늦어도 8세기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빌론 유수와 유수 이후 초기에 우위를 차지하기 전에 소규모 정당의 관심사로 남아있었다.[12] 이 파벌의 초기 지지자들은 진정한 유일신론자라기보다 일신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13] 그들은 야훼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라고 믿는 대신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14] 바빌론 유수라는 국가 위기 동안 야훼의 추종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침내 야훼 이외의 다른 신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함으로써 일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야훼교에서 유대교로의 전환을 표시했다.[15] 일부 학자들은 널리 퍼진 일신교의 시작을 기원전 8세기로 추정하고 이를 신아시리아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보고 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함락되어 바빌론 유수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원래 포로 생활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유다에 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문헌의 저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인"이었다.[3]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주였으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와 연결되어 귀환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그들이 옛 "야훼" 운동의 후예를 대표했지만 그들이 제정하게 된 종교는 군주제 야훼교와는 상당히 달랐다.[3] 차이점에는 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성문법과 이에 따른 성서에 대한 새로운 초점,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의 통혼을 금지함으로써 순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포함되었다. 이 새로운 믿음은 유대교 발전의 다음 단계인 제2성전 유대교를 나타낸다.[3]
기원전 587/6년, 예루살렘은 신바빌로니아에 함락되었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지도자들은 유배되었다.[18] 이후 50년간의 바빌론 유배 기간은 이스라엘 종교 역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스라엘 외부에서는 야훼께 전통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에 (아래 참조), 안식일 준수와 할례 등 다른 관습들이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19] 제2이사야의 저술에서 야훼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었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의 계약을 준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약속을 확대하는 것으로 여겨졌다.[20] 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페르시아 정복자 키루스 2세에게 함락되자, 유배자들은 귀환 허가를 받았다 (비록 소수만이 귀환했지만),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에는 제2성전이 건립되었다.[21]
제2성전 시대 말엽에는 공공장소에서 야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22] 성경을 낭독할 때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나의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אֲדֹנָי)라는 단어로 대체하기 시작했다.[22]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성전에서 단 한 번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었고,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22] 헬레니즘 시대 동안, 성경은 이집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23]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은 테트라그램마톤과 ''아도나이'' 모두를 "주"를 뜻하는 ''퀴리오스''(κύριος)로 번역한다.[22]
페르시아 지배 시대에는 야훼의 대표자로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을 통치할 미래의 인간 왕, 즉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발전하였다. 이를 처음 언급한 사람들은 초기 페르시아 시대의 예언자였던 학개와 스가랴이다. 그들은 메시아를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서 보았는데, 그는 잠시나마 고대 왕가를 재건할 것처럼 보였다. 또는 스룹바벨과 최초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서 보았다 (스가랴는 왕족 메시아와 제사장 메시아 두 명을 언급한다). 이러한 초기의 희망은 좌절되었고 (스룹바벨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대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 후로는 단순히 다윗의 메시아 (즉, 후손)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만이 남았다.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나중에 제2성전 유대교가 등장하였고, 이로부터 기독교, 랍비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생겨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일신교를 받아들인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제1성전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야훼만을 숭배하기 시작한 시점은 불분명하다. 야훼를 "땅을 축복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주요 신으로 묘사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9세기 엘리야 선지자의 가르침에 나타난다. 이러한 숭배 형태는 기원전 8세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야훼와 바알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이미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12] 이러한 파벌의 초기 지지자들은 진정한 일신교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일신론자로 널리 여겨진다. 즉, 그들은 야훼가 유일한 신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다.[14]
마침내, 바빌론 유수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야훼의 추종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야훼 외의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일신론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다.[15] 야훼가 온 세상의 창조주로 숭배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다른 신들에 대한 야훼의 권능과 바빌로니아 종교의 신들에 대한 그의 비교 불가능성과 유일성을 근거로 삼는, 기원전 6세기 유배 시대의 작품인 신이사야에 의해 처음으로 자세히 설명된다.
벤자민 D. 좀머는 다신교와 일신교 사이의 구분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한다.[28]
7. 2. 신약성서의 영향
신약성서에서 야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드물다. 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며, 야훼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는 신약성서에서 야훼가 예수의 아버지로서 간접적으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야훼가 삼위일체의 한 위격인 성부로 이해된다. 즉, 야훼는 성자 예수, 성령과 함께 하나의 신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유대교의 야훼 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유대교에서는 야훼는 유일하고 불가분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와 기독교 신학은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킴으로써, 야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이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서를 공유했지만, 야훼에 대한 이해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울로를 비롯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야훼의 현현으로 보았고, 이는 삼위일체 교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7. 3. 현대적 해석
현대 신학에서는 야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유대교 및 기독교 신학에서는 야훼를 전능하고 초월적인 신으로 묘사하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야훼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일부 신학자들은 야훼를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 고통받고 연대하는 신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은 해방신학이나 과정신학 등에서 나타나며, 야훼를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신으로 강조한다.解放神學/해방신학한국어은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야훼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을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다른 신학자들은 야훼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시도한다. 이들은 야훼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로 보면서도, 인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며 영향을 미치는 신으로 이해한다.過程神學/과정신학한국어은 야훼를 변화하는 세계와 함께 끊임없이 발전하는 존재로 묘사하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야훼 또한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야훼를 남성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여성적인 면모를 지닌 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들은 전통적인 신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여 야훼의 모성적 사랑과 포용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해석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해방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해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일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현대 신학의 해석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야훼의 초월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며, 현대적 해석이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야훼를 재해석한다고 주장한다.
현대 신학에서의 야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끊임없는 논쟁과 연구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야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개인의 신앙 경험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논쟁은 진보와 보수, 여성주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야훼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신앙적 고민을 반영한다.
8. 숭배
야훼 숭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야훼교에서는 축제, 희생, 서원, 사적인 의식, 법적 분쟁의 판결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당시 다른 셈족 종교에서도 관찰되는 특징이다.
야훼 숭배의 중심에는 시골 생활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3개의 큰 연례 축제가 있었다. 이는 어린 양의 탄생제인 유월절, 곡식 수확제인 칠칠절, 과일 수확제인 초막절이다. 이 축제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화에 나오는 사건들과 관련이 깊다. 유월절은 이집트 탈출을, 칠칠절은 시나이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을, 초막절은 광야 방랑을 기념한다. 이러한 축제들은 초기의 농업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야훼의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동물 공희는 야훼교와 유대교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서기 70년 제2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제사를 지낸 후 제단을 태우고 피를 뿌리는 유대인의 관습은 성경에서 매일의 성전 의식으로 묘사되었다. 희생은 아마도 노래나 시편 낭송으로 보완되었을 것이다. 레위기 1-16장에 자세히 설명된 의식은 순결과 속죄에 대한 강조와 함께 바벨론 포로 이후 야훼교/유대교 전환 후에 더욱 중요해졌다. 사실, 가장이라면 누구라도 경우에 따라 희생을 바칠 수 있었다.
히브리어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야훼의 중심이자 유일한 성전으로 여겨졌다는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숭배 장소가 존재했다. 가장 초기의 이스라엘 숭배 장소는 기원전 12세기 사마리아 언덕에 있는 야외 제단으로, 가나안 신 황소 엘(황소 형태의 엘)을 연상시키는 청동 황소가 특징이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단, 네게브의 아라드와 유다 지역의 베에르셰바에서도 다른 성전의 고고학적 유적이 발견되었다. 실로,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그리고 단은 축제, 희생 제사, 서원, 개인 의식, 그리고 법적 분쟁의 판결을 위한 주요 장소이기도 했다.
야훼 숭배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상 금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초기 이스라엘의 숭배는 아마도 돌기둥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케루빔이 야훼의 보좌 형태로 있었고, 그들의 안쪽 날개가 자리를 이루고 상자가 (언약궤) 받침이 되었지만, 보좌 자체는 비어 있었다. 이러한 우상 금지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없으며, 많은 학자들은 야훼가 군주국 시대 후반 히즈키야와 요시야의 개혁 이전에 묘사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초기 우상 금지는 탈출기 이후의 상상의 투영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탈출기 이전 시대에 야훼의 어떤 인간형 묘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8. 1. 절기와 희생제사
야훼교는 축제, 희생, 서원, 사적인 의식, 법적 분쟁 판결 등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당시 다른 셈족 종교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야훼 숭배의 중심에는 시골 생활의 주요 사건과 관련된 3개의 큰 연례 축제가 있었다. 이는 유월절(어린 양의 탄생제), 칠칠절(곡식 수확제), 초막절(과일 수확제)이다.[1] 이 축제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화 속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유월절은 이집트 탈출, 칠칠절은 시나이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초막절은 광야 방랑과 연관된다.[2] 따라서 축제들은 초기 농업적 의미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야훼의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기념했다.[3]동물 희생은 야훼교와 유대교(서기 70년 제2성전 파괴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희생 제사 후에는 제단을 태우고 피를 뿌리는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성경에서 매일의 성전 의식으로 묘사된 유대인의 관습이다. 희생은 노래나 시편 낭송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4] 레위기 1-16장에 자세히 설명된 의식은 순결과 속죄를 강조하며, 바벨론 포로 이후 야훼교/유대교로 전환된 후에야 따랐다. 사실, 가장이라면 누구나 필요에 따라 희생을 바칠 수 있었다.[4]
야훼 숭배에는 유월절(양의 출산), 샤부오트(곡물 수확), 수콧(과일 수확)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연례 축제가 있었다.[5] 이 축제들은 야훼 종교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5], 이스라엘의 국가 신화와 연결되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의 출애굽과, 샤부오트는 시나이 산에서의 율법 수여와, 수콧은 광야 방황과 관련되었다.[6] 따라서 이 축제들은 야훼의 이스라엘 구원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기념했지만, 초기 농업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7]
많은 학자들은 레위기 1-16장에 자세히 설명된 의식, 즉 순결과 속죄에 대한 강조가 바빌론 유수 이후에 도입되었으며, 가족의 가장이 필요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8] 일부 학자들은 갓난아이 제사가 기원전 7세기 후반 요시야 왕의 개혁 이전까지 이스라엘/유다 종교의 일부였다고 주장한다. 제사는 시편 낭송으로 보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4] 기도는 공식적인 예배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9]
8. 2. 성전
야훼교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의 3개의 큰 연례 축제가 야훼 숭배의 중심이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탄생제, 칠칠절은 곡식 수확제, 초막절은 과일 수확제이다. 이 축제들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화에 나오는 사건, 즉 유월절은 이집트 탈출, 칠칠절은 시나이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 초막절은 광야 방랑과 관련되어 있다. 축제들은 야훼의 이스라엘 구원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기념했다.동물 공희는 야훼교와 유대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2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서기 70년까지 제사를 지낸 후 제단을 태우고 피를 뿌리는 유대인의 관습은 성경에서 매일의 성전 의식으로 묘사되었다. 희생은 아마도 노래나 시편 낭송으로 보완되었을 것이다. 레위기 1-16장에 자세히 설명된 의식은 순결과 속죄에 대한 강조와 함께 바벨론 포로와 야훼교/유대교 전환 후에야 따랐다.
히브리어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야훼의 중심이자 유일한 성전으로 여겨졌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가장 초기의 이스라엘 숭배 장소는 기원전 12세기 사마리아 언덕에 있는 야외 제단으로, 가나안 신 황소 엘(황소 형태의 엘)을 연상시키는 청동 황소가 특징이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단, 네게브의 아라드와 유다 지역의 베에르셰바에서도 다른 성전의 고고학적 유적이 발견되었다. 실로,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그리고 단은 축제, 희생 제사, 서원, 개인 의식, 그리고 법적 분쟁의 판결을 위한 주요 장소이기도 했다.
8. 3. 표현
야훼 숭배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상 금지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야훼가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숭배는 아마도 돌기둥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케루빔이 야훼의 보좌 형태로 있었고, 그들의 안쪽 날개가 자리를 이루고 상자가 (언약궤) 받침이 되었지만, 보좌 자체는 비어 있었다.이러한 우상 금지에 대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없으며, 많은 학자들은 야훼가 사실상 군주국 시대 후반 히즈키야와 요시야의 개혁 이전에 묘사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연구를 인용하자면, "[초기 우상 금지는 사실상 그렇게 여겨졌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탈출기 이후의 상상의 투영일 뿐이다]". 다른 학자들은 탈출기 이전 시대에 야훼의 어떤 인간형 묘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9. 그리스-로마 문화와의 융합
야훼는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에서 이아오(Iao), 아도나이(Adonai), 사바옷(Sabaoth), 엘로아이(Eloai) 등으로 불리며, 그리스-로마 신들, 이집트 신들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등의 대천사와 아브라함, 야곱, 모세 같은 유대 문화 영웅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는 그리스-로마 민간 마법사들이 외국 신의 권위를 빌려 주문의 효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훼는 바쿠스(Bacchus), 즉 디오니소스(Dionysus)와 자주 동일시되었다. 폼페이우스의 유대 정복 기념 동전에는 "BACCHIVS IVDAEVS"라는 문구와 함께 무릎 꿇은 수염 기른 인물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유대인 바쿠스'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동전이 아리스토불루스 2세(Aristobulus II)의 항복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훼를 디오니소스의 지역적 변형으로 본 해석도 존재한다.[15][16][17] 타키투스, 요한 뤼디우스, 코르넬리우스 라베오,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 역시 야훼를 바쿠스-디오니소스와 동일시했다.[18][19][20] 유대인들이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키릭스(kylix), 암포라(amphora), 담쟁이덩굴(ivy) 잎, 포도(grapes) 등의 상징을 사용한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를 근거로 유대인들이 디오니소스의 실체화된 형태를 숭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18][19][20] 플루타르코스는 ''도덕집(Moralia)''의 ''연회의 질문''에서 유대인들이 "에우오이(Euoi)"와 "사비(Sabi)"라는 함성으로 신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는 디오니소스 숭배 의식과 관련된 표현이다.[18][19][20] 션 맥도너에 따르면, 그리스어 사용자들은 아람어인 안식일(Sabbath), 할렐루야(Alleluia)나 야훼의 이름 변형을 디오니소스 관련 용어와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18][19][20]
한편 유베날리스, 페트로니우스, 플로루스 같은 로마 작가들은 야훼를 신 카엘루스(Caelus)와 동일시하기도 했다.
9. 1.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의 그리스-로마 마법 관련 문서, 특히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에서 야훼는 이아오(Iao), 아도나이(Adonai), 사바옷(Sabaoth), 엘로아이(Eloai)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된다.[1] 이러한 문서에서 야훼는 전통적인 그리스-로마 신들과 이집트 신들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2] 대천사인 미카엘(Michael), 가브리엘(Gabriel), 라파엘(Raphael), 우리엘(Ouriel)과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유대인 문화 영웅들도 자주 언급된다.[3] 야훼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민간 마법사들이 권위 있는 외국 신을 불러냄으로써 주문의 효력을 높이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2]폼페이우스가 유대 지방 정복을 기념하여 발행한 동전에는 무릎을 꿇고 수염을 기른 인물이 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로마의 일반적인 항복의 상징), "BACCHIVS IVDAEVS"라고 적혀 있다. 이는 "유대인 바쿠스(Bacchus)" 또는 "유대인 바쿠스"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인물은 야훼를 바쿠스, 즉 디오니소스(Dionysus)의 지역적 변형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4] 그러나 이러한 상징으로 주조된 동전은 일반적으로 정복당한 백성의 신이 아니라 정복당한 사람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동전이 단순히 "바키우스(Bacchius)"라는 이름의 유대인의 항복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폼페이우스의 원정으로 몰락한 하스모네아 왕조의 왕 아리스토불루스 2세(Aristobulus II)로 확인하기도 한다.[5][6][7]
어찌 되었든, 타키투스(Tacitus), 요한 뤼디우스(John the Lydian), 코르넬리우스 라베오(Cornelius Labeo),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Marcus Terentius Varro)는 야훼를 바쿠스-디오니소스와 동일시했다.[8] 유대인 자신들도 키릭스(kylix), 암포라(amphora), 담쟁이덩굴(ivy) 잎, 포도(grapes)송이와 같이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상징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러한 유사성을 플루타르코스(Plutarch)는 유대인들이 바쿠스-디오니소스의 실체화된(hypostasized) 형태를 숭배한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했다.[9]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저서 ''연회의 질문(Quaestiones Convivales)''에서 유대인들이 "에우오이(Euoi)"와 "사비(Sabi)"라는 함성으로 그들의 신을 찬양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디오니소스 숭배와 관련된 구절이다.[10][11][9] 션 맥도너(Sean M. McDonough)에 따르면, 그리스어 사용자들은 아람어 단어인 안식일(Sabbath), 할렐루야(Alleluia), 또는 야훼의 이름의 어떤 변형을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보다 친숙한 용어와 혼동했을 수 있다.[12]
유베날리스(Juvenal), 페트로니우스(Petronius), 플로루스(Florus)와 같은 다른 로마 작가들은 야훼를 신 카엘루스(Caelus)와 동일시했다.[13][14][15]
9. 2. 바쿠스와의 동일시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5세기까지의 그리스-로마 마법 관련 문서, 특히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에서 야훼는 이아오(Iao), 아도나이(Adonai), 사바옷(Sabaoth), 엘로아이(Eloai)라는 이름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문서에서 야훼는 전통적인 그리스-로마 신들과 이집트 신들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과 같은 대천사와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유대인 문화 영웅들도 자주 언급된다. 야훼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민간 마법사들이 권위 있는 외국 신을 불러냄으로써 주문의 효력을 높이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폼페이우스가 유대 지방 정복을 기념하여 발행한 동전에는 무릎을 꿇고 수염을 기른 인물이 가지를 잡고 있는 모습(로마의 일반적인 항복의 상징)이 새겨져 있는데, "BACCHIVS IVDAEVS"라고 적혀 있다. 이는 "유대인 바쿠스(Bacchus)" 또는 "유대인 바쿠스"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인물은 야훼를 바쿠스, 즉 디오니소스(Dionysus)의 지역적 변형으로 묘사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으로 주조된 동전은 일반적으로 정복당한 백성의 신이 아니라 정복당한 사람들을 묘사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동전이 단순히 "바키우스(Bacchius)"라는 이름의 유대인의 항복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폼페이우스의 원정으로 몰락한 하스모네아 왕조의 왕 아리스토불루스 2세(Aristobulus II)로 확인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타키투스, 요한 뤼디우스, 코르넬리우스 라베오, 마르쿠스 테렌티우스 바로는 야훼를 바쿠스-디오니소스와 동일시했다. 유대인 자신들도 키릭스(kylix), 암포라(amphora), 담쟁이덩굴(ivy) 잎, 포도(grapes)송이와 같이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상징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러한 유사성을 플루타르코스는 유대인들이 바쿠스-디오니소스의 실체화된(hypostasized) 형태를 숭배한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저서 ''도덕집(Moralia)''의 ''연회의 질문(Quaestiones Convivales)''에서 유대인들이 "에우오이(Euoi)"와 "사비(Sabi)"라는 함성으로 그들의 신을 찬양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디오니소스 숭배와 관련된 구절이다. 션 맥도너(Sean M. McDonough)에 따르면, 그리스어 사용자들은 아람어 단어인 안식일(Sabbath), 할렐루야(Alleluia), 또는 야훼의 이름의 어떤 변형을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보다 친숙한 용어와 혼동했을 수 있다.
유베날리스, 페트로니우스, 플로루스와 같은 다른 로마 작가들은 야훼를 신 카엘루스(Caelus)와 동일시했다.
10. 다양한 종교에서의 야훼
다양한 종교에서의 야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여러 종교에서 야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숭배된다. 각 종교 내에서 야훼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에서 야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יהוה(야훼)"를 "주"로 번역하며, 이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28] "아도나이"는 "주"라는 의미 외에 "나의 주인"이라는 뜻도 포함한다.[29][30][31][32][33] 가톨릭 교회 계열의 바르바로 역과 표준어역 성경, 새번역 성경 등도 "주"로 번역한다.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계열의 개역개정에서는 "'''주'''"로 굵게 표기하여 일반적인 <주>와 구분한다.[34][35] 1893년 대한성공회 역시 "주"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구약성경에서는 엘(엘) 또는 엘로힘(אלהים)[38]도 야훼의 호칭으로 사용되며, 한국어 성경은 한역 성서의 번역어를 따라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느님" 등으로 번역된다. 중국어 성경은 "神" 외에도 "上帝"로 번역하기도 했다.[39]
"神"이라는 글자는 Robert Morrison의 한문 성경에서 비롯되었으나,[40][41] 이후 선교사들 사이에서 번역어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브리지먼·칼버트슨의 한문역 성경은 "神"을 채택했고,[42][43] 많은 한글 성경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았다.[44] 1938년 전도일은 "神"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45] 신약성경에는 테트라그라마톤(YHWH)이 나타나지 않지만, 20세기 중반 사해 문서에서 발견된 1세기경 칠십인역 성경 사본에는 야훼(יהוה)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는 신약성경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63][64] "Ἐγώ εἰµι ὁ ὤν(에고 에이미 호 오온)"("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는 예수와 야훼를 연결 짓는 표현으로, 예수가 자신이 야훼와 밀접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65]
삼위일체 교리 성립 후, 야훼는 특정 위격과 연결된 이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서방 교회에서는 야훼(에호바)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고, 동방 교회에서는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83] 2008년 바티칸 교황청은 전례에서 신성 4자를 사용하거나 발음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84]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는 기도나 성가에서 "야훼"를 "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장 칼뱅(Jean Calvin)은 하나님을 "생명과 의와 지혜와 능력과 선과 자비의 근원"이라고 묘사했다.[85] 헨리 시센(Henry Sensen)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도덕적 속성(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불변성)과 도덕적 속성(거룩하심, 의와 공의, 선, 진실)으로 분류했다.[86] 엘 베르코프(L. Berkhof)는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적 속성과 유사 속성으로 나누었다.[87] 플로이드 해밀턴(Floyd Hamilton)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일치성을 강조하며,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반박했다.[88]
이슬람교에서는 야훼를 알라 또는 알라의 아랍어 명칭으로 부른다.
신이 꾸란을 내렸다고 여겨지는 무함마드는 신으로부터 파견된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신의 계시를 아랍어로 전달받은 사도이자,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여겨진다. 무함마드는 신으로부터 창조된 인류를 위해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존재일 뿐이다. 애초에 신 자신이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는다”[89]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고유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상처럼 무함마드를 “신의 아들”로 보는 종교적·신학적 위치는 부여되지 않는다. 알라는 유일무이하고 전지전능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눈 없이 보고, 귀 없이 듣고, 입 없이 말한다”고 여겨지는 (의지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으며(편재),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슬람교가 이미지를 사용한 예배를 우상숭배로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유대교·기독교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알라는 유대교·기독교의 야훼와 같다고 여겨진다.[90] (유대교, 기독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라는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했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인류를 죽은 자까지 부활시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종말”을 주관한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한 전능한 신(알라)이 휴식을 취할 리 없다는 관점에서, 창조의 엿새 후에 신이 휴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부정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91] 이는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은 “경전의 종교”로 존중하면서도, 그 가르침에 인위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아 온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꾸란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무함마드 사후이지만, 이슬람교도들은 신이 보낸 대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전한 말씀이 현재의 꾸란에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라스타파리 운동에서는 야훼를 "Jah"라는 형태로 숭배한다. 야훼의 이름 약칭인 "야"(야)(Jahhe-Latn)는 히브리어 "할렐루야"(Hallelujahhe-Latn)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한다.
10. 1. 유대교
유대교에서 야훼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유대인들은 야훼를 자신들의 유일신으로 숭배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한국어 성경에서는 야훼를 일반적으로 "주"로 번역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발음하는 것을 꺼리는 관습을 따른 것이다.[28] 오늘날 유대인들은 야훼 대신 "아도나이"(’Ăḏōnay/אֲדֹנַיhe)라고 발음하며, 이는 "나의 주"라는 의미를 지닌다.[29] "아도나이"는 야훼를 완곡하게 가리키는 표현이며, 일반적인 주인을 의미하기도 한다.[30][31][32][33]
가톨릭 교회 계열의 『바르바로 역』과 『표준어역 성경』( 대한성서공회) 등에서도 "주"로 번역하며, 『새번역 성경』 역시 일부 지명을 제외하고는 "주"로 일관되게 번역한다.
프로테스탄트복음주의 계열의 『개역개정』에서는 "'''주'''"를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야훼를 지칭하는 "'''주'''"와 일반적인 "주"를 구분한다.[34][35] 1893년 당시 대한성공회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구약성서에서는 일반 명사인 엘(אלhe) (엘로힘)도 야훼의 호칭으로 사용된다.[38] 한국어 성경에서는 엘로힘을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능한,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샤다이를 붙여 엘 샤다이로 표현하기도 한다. 중국어 성경에는 야훼를 "神" 또는 "上帝"로 번역한 경우가 많았으며, 개역한글판 성경도 이를 따라 "神"으로 표기하면서 "上帝"와 같은 자간으로 띄어 쓴 경우가 많다.[39]
"神"이라는 글자는 원래 로버트 모리슨이 한문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용어인데,[40][41] "神"의 번역어로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브리지먼·칼버트슨의 한문역 성경은 "神"을 채택했다.[42][43]
많은 한글 성경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았으며,[44] 1938년 전도일이 "神"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한 적은 있지만,[45] 오늘날까지 "神"을 번역어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테트라그라마톤(YHWH)은 현존하는 신약성경 사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死海文書에서 발견된 1세기경의 칠십인역 성경 사본에는 하나님의 이름 "יהוהhe(야훼)"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신약성경에도 처음에는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3][64]
10. 2. 기독교
기독교에서 야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יהוה(야훼)"를 "주"로 번역하는데, 이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28]"아도나이"는 "주"라는 의미 외에도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29][30][31][32][33] 가톨릭 교회 계열의 바르바로 역과 표준어역 성경, 새번역 성경 등도 "주"로 번역한다.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계열의 개역개정에서는 "'''주'''"로 굵게 표기하여 일반적인 <주>와 구분한다.[34][35] 1893년 대한성공회 역시 "주"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구약성경에서는 엘(엘) 또는 엘로힘(אלהים)[38]도 야훼의 호칭으로 사용되며, 한국어 성경은 한역 성서의 번역어를 따라 "하느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느님" 등으로 번역된다. 중국어 성경은 "神" 외에도 "上帝"로 번역하기도 했다.[39]
"神"이라는 글자는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의 한문 성경에서 비롯되었으나,[40][41] 이후 선교사들 사이에서 번역어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브리지먼·칼버트슨의 한문역 성경은 "神"을 채택했고,[42][43] 많은 한글 성경이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았다.[44] 1938년 전도일은 "神"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45]
신약성경에는 테트라그라마톤(YHWH)이 나타나지 않지만, 20세기 중반 사해 문서에서 발견된 1세기경 칠십인역 성경 사본에는 야훼(יהוה)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초기에는 신약성경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63][64]
"Ἐγώ εἰµι ὁ ὤν(에고 에이미 호 오온)"("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는 예수와 야훼를 연결 짓는 표현으로, 예수가 자신이 야훼와 밀접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여겨진다.[65]
삼위일체 교리 성립 후, 야훼는 특정 위격과 연결된 이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서방 교회에서는 야훼(에호바)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고, 동방 교회에서는 야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83]
2008년 바티칸 교황청은 전례에서 신성 4자를 사용하거나 발음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며,[84]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는 기도나 성가에서 "야훼"를 "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장 칼뱅(Jean Calvin)은 하나님을 "생명과 의와 지혜와 능력과 선과 자비의 근원"이라고 묘사했다.[85] 헨리 시센(Henry Sensen)은 하나님의 속성을 비도덕적 속성(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불변성)과 도덕적 속성(거룩하심, 의와 공의, 선, 진실)으로 분류했다.[86] 엘 베르코프(L. Berkhof)는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적 속성과 유사 속성으로 나누었다.[87] 플로이드 해밀턴(Floyd Hamilton)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일치성을 강조하며,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반박했다.[88]
10. 3. 이슬람교
이슬람교에서는 야훼를 알라 또는 알라의 아랍어 명칭으로 부른다.신이 꾸란을 내렸다고 여겨지는 무함마드는 신으로부터 파견된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신의 계시를 아랍어로 전달받은 사도이자,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여겨진다. 무함마드는 신으로부터 창조된 인류를 위해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존재일 뿐이다. 애초에 신 자신이 “낳지도 않고, 낳아지지도 않는다”[89]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고유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상처럼 무함마드를 “신의 아들”로 보는 종교적·신학적 위치는 부여되지 않는다.
알라는 유일무이하고 전지전능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눈 없이 보고, 귀 없이 듣고, 입 없이 말한다”고 여겨지는 (의지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존재할 수 있으며(편재),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슬람교가 이미지를 사용한 예배를 우상숭배로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유대교·기독교를 확증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알라는 유대교·기독교의 야훼와 같다고 여겨진다.[90] (유대교, 기독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알라는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했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인류를 죽은 자까지 부활시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는 “종말”을 주관한다.
이슬람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한 전능한 신(알라)이 휴식을 취할 리 없다는 관점에서, 창조의 엿새 후에 신이 휴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부정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91] 이는 이슬람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은 “경전의 종교”로 존중하면서도, 그 가르침에 인위적인 변경이 있다고 보아 온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꾸란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무함마드 사후이지만, 이슬람교도들은 신이 보낸 대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전한 말씀이 현재의 꾸란에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10. 4. 기타 종교
라스타파리 운동에서는 야훼를 "Jah"라는 형태로 숭배한다. 야훼의 이름 약칭인 "야"(야)()는 히브리어 "할렐루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한다.11. 기원에 관한 여러 학설
야훼 신앙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독일 작가 프리드리히 빌헬름 길라니는 겐족 가설을 제안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야훼는 원래 미디안의 신이었으며, 모세의 장인과 미디안의 연관성은 히브리인들이 미디안 숭배를 받아들인 역사를 반영한다.[101][102][103] 모세는 이드로의 신 야훼를 이스라엘의 신 엘 샤다이와 동일시했다.[101] 겐족 가설은 히브리인들이 겐족을 통해 미디안인들에게서 야훼 숭배를 받아들였다고 본다. 이 가설은 1862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길라니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이후 코르넬리스 틸레, 베른하르트 슈타데, 카를 부데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104] 헤르만 구테, Gerrit Wildeboer, H. P. Smith, George Aaron Barton 등도 이 가설을 지지했다.[105] 또 다른 이론은 지역 부족 연합이 시나이에서 일신교 의식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106]
초기 여호와 문서는 겐족 가설을 뒷받침한다. 성경에는 야훼가 유다 왕국 남쪽 땅에 거주했다는 구절이 다섯 차례 등장한다. 신명기 33:2, 사사기 5:4, 하박국 3:3, 3:7, 이사야 63:1 등이 그 예이다. 이 구절들은 야훼가 미디안과 에돔 땅에서 왔으며, 보스라, 세일 산, 바란 산과 같은 특정 장소나 데만에서 왔다고 묘사한다.
블렌킨소프(2008)는 기존 증거를 재검토하여 겐족 가설이 현재 이용 가능한 최고의 설명이라고 결론지었다. 테베스(2021)는 남부 레반트와 북부 아라비아의 성경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 동안 가나안에 대한 "미디안" 영향을 문화 전승 과정으로 제시한다.[107]
야훼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된 의견이 없다.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만 발견되며, 어원에 대한 합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3:14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설명은 후대의 신학적 주석으로 여겨진다.
야훼의 이름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아멘호테프 3세 시대의 비문에 있는 이집트어 지명 "tꜣ šꜣsw Yhwꜣ", 즉 "야훼의 샤수의 땅"(tꜣ šꜣsw Yhwꜣ)이다.[11][12] 샤수는 북아라비아의 미디안과 에돔 출신 유목민이었다.[13] "yhwꜣ"와 "YHWH"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불확실하지만,[6] 야훼가 세이르 산, 에돔, 바란 광야, 데만 등 남부 지역 출신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야훼가 어떻게 북쪽으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케닌 가설은 상인들이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대상 길을 따라 야훼를 이스라엘로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이 가설은 야훼가 가나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성경 속 에돔과 미디안과의 관계, 모세와 케닌 또는 미디안과의 연관성 등을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모세의 역사적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약점이 있다. 케닌 가설을 지지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리고 초기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야훼를 만났다고 가정해야 한다. 크리스티안 프레벨은 "데만의 야훼"와 같은 비문이 단순히 후대에 그곳에 존재했음을 나타낼 뿐이며, 데만이 유다를 포함한 남쪽 지역을 가리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7]
한편, 일부 학자들은 YHWH 숭배가 이스라엘 왕국의 토착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므리 왕조에 의해 유다 왕국에서 장려되었다고 주장한다.[7][8] 프레벨은 하자엘의 이스라엘 왕국 정복이 두 왕국을 협력하게 만들어 유다 백성 사이에 YHWH 숭배가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7]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야훼의 기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다. 야훼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만 확인되며, 어원에 대한 합의는 없다.[1] 출애굽기 3:14에 제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설명은 후대의 신학적 주석으로 간주되기도 한다.[2]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마리 문서에서 발견되는 아모리트어 요소 "yahwi-"와 연결하기도 한다.[3] 프랭크 무어 크로스는 "yahwi-"를 신의 칭호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며,[5] J. 필립 하얏트는 "yahwi-"가 신생아의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7] 힐렐 벤-사손은 "yahwi-"가 어근 "hwy"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8]
또 다른 학설은 "야훼"가 "엘(El)은 군대를 창조하는 자"라는 "ˀel ḏū yahwī ṣabaˀôt"의 축약형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9] 크로스는 이를 엘의 숭배 이름 중 하나로 보았다.[5] 그러나 이 문구는 성경 안팎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엘과 야훼는 서로 다른 신으로 여겨진다.[10]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 야훼(YHWH)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인간의 창조주로 여겨지며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성서 비평가들은 유대교 성립 이전의 신앙을 야훼 신앙 또는 엘로힘 신앙이라고 부르며, 이 둘이 반드시 같다고 보지는 않는다. 4원설에서는 엘 또는 엘로힘을 신의 호칭으로 하는 'E 자료'와 야훼를 신의 이름으로 하는 'J 자료'를 구분한다. 엘로힘은 셈족 여러 민족에게서 보이는 다신교의 최고신으로, 추상적인 하늘의 신이었다. 야훼는 엘로힘보다 시대적으로 뒤쳐지며, 구체적인 인격신으로 감정이 풍부한 신이었다. 일각에서는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이 고대 이집트의 아텐 신을 믿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한다.[92]
11. 1. 문서 가설
야훼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4] 야훼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만 발견되며, 그 어원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설명은 후대에 만들어진 신학적 해석으로 여겨진다.[4]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4]일부 학자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마리 문서에서 발견되는 아모리트어 요소인 "yahwi-"("ia-wi")와 연결시키는데, 이는 "생명을 가져오다/존재하게 하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yahwi-dagan"은 "다곤이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이다.[4] 그러나 프랭크 무어 크로스는 아모리트어 동사형이 야훼라는 이름의 동사 어근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만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yahwi-"를 신의 칭호로 받아들이는 시도에 반대했다.[4] J. 필립 하얏트는 "yahwi-"가 우주가 아닌 신생아의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이 더 인기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yahwi-"와 인간 조상과의 연관성을 제거하고 다른 요소들과 결합했다. 힐렐 벤-사손은 아모리트인들이 신을 위해 "yahwi-"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yahwi-" 또는 "yawi"가 "그는 될 것이다"를 의미하는 어근 "hwy"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설은 "야훼"가 "엘은 군대를 창조하는 자"라는 "ˀel ḏū yahwī ṣabaˀôt"의 축약형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4] 크로스는 이를 엘의 숭배 이름 중 하나로 보았다.[4] 그러나 이 문구는 성경 안팎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엘은 야훼와 달리 노년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이며 폭풍과 전투와 관련이 없다.[4] 또한 야훼는 일반적으로 비능동적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YHWH는 YHYH로 번역될 것이기 때문이다.[4]
야훼의 이름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아멘호테프 3세(기원전 1390~1352년) 시대의 비문에 있는 이집트어 지명 "tꜣ šꜣsw Yhwꜣ", "야훼의 샤수의 땅"이다. 샤수는 북아라비아의 미디안과 에돔 출신 유목민이었다.[4] "yhwꜣ"와 신명 "YHWH"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불확실하지만, 야훼는 세이르 산, 에돔, 바란 광야, 데만과 관련된 남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4] 이러한 견해에 대한 지지는 많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야훼가 어떻게 북쪽으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4]
많은 학자들이 케닌 가설을 지지하는데, 이는 상인들이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대상 길을 따라 야훼를 이스라엘로 가져왔다는 것이다.[4] 이는 야훼가 가나안에 없는 점, 성경 이야기에서 에돔과 미디안과의 관계, 모세와 케닌 또는 미디안과의 연관성과 같은 여러 사실을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모세의 역사적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약점이 있다.[4] 케닌 가설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야훼를 만났다고 가정해야 한다.[4] 크리스티안 프레벨은 야훼의 남쪽 기원을 시사하는 비문(예: "데만의 야훼")은 단순히 후대에 그곳에 존재했음을 나타낼 뿐이며, 데만은 유다를 포함한 남쪽 지역을 가리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4]
일부 학자들은 YHWH 숭배가 이스라엘 왕국의 토착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옴리 왕조에 의해 유다 왕국에서 장려되었다고 주장한다.[4] 프레벨은 하자엘의 이스라엘 왕국 정복이 두 왕국을 협력하게 만들어 유다 일반 백성 사이에 YHWH 숭배가 퍼져나갔다고 주장한다. 이전에는 YHWH가 유다 국가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4]
창세기 2장에서 야훼(YHWH)는 인간의 창조주로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숭배되어 온 유일신으로 묘사된다.
성서 비평가들에 따르면, 유대교 성립 이전의 신앙은 야훼 신앙 또는 엘로힘 신앙으로 불리는데, 이 두 신앙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 문서 가설에서는 엘(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 또는 그 복수형인 엘로힘을 신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E 자료'와 야훼를 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J 자료'가 상정된다. 두 신앙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신앙 체계였으나, 유일신교화 과정에서 혼동되어 동일한 신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엘로힘은 야훼보다 더 오래된 신앙으로, 원래는 셈족 여러 민족에게서 볼 수 있는 다신교의 최고신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늘의 신이었다. 엘로힘은 사마리아나 갈릴리 등 북부 지역에서 숭배되었다. 반면 야훼는 엘로힘보다 시대적으로 뒤쳐져 있으며, 추상적인 엘로힘과 달리 구체적인 인격신으로, 자애뿐만 아니라 분노와 질투를 표출하는 감정이 풍부한 신이었다. 야훼는 원래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남부의 신앙이었고, 왕국 시대에는 엘로힘과 달리 레위 지파 사제 계급이 야훼의 의례를 담당하며 유일신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한편, 유일신교화 시대를 더 오래 전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은 고대 이집트의 아텐 신을 믿었고, 아텐 신앙이 폐지된 후 탄압을 피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설도 있다.[92]
11. 2. 자유주의 신학
야훼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가 없다.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만 확인되며, 어원에 대한 합의는 없다. 출애굽기 3:14에 제시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설명은 원래 의미가 잊혀진 시기에 만들어진 후대의 신학적 주석(gloss)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Lewis는 마리 문서에서 발견되는 아모리트어 요소인 "yahwi-"("ia-wi")와 그 이름을 연결하는데, 이는 "생명을 가져오다/존재하게 하다"를 의미한다(예: "yahwi-dagan" = "다곤(Dagon)이 존재하게 하다"). 이는 아카드어 "ibašši-"DN과 의미상 동등어로 일반적으로 표기된다. 하지만 프랭크 무어 크로스(Frank Moore Cross)는 아모리트 동사형은 "야훼"라는 이름의 동사 어근을 재구성하려는 시도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yahwi-"를 신의 칭호로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반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6] 게다가 J. 필립 하얏트(J. Philip Hyatt)는 "yahwi-"가 우주가 아닌 신생아의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yahwi-"와 어떤 인간 조상과의 연관성을 제거하고 다른 요소들(예: "Yahweh ṣəḇāʾōṯ")과 결합했다.[7] 힐렐 벤-사손(Hillel Ben-Sasson)은 아모리트인들이 신을 위해 "yahwi-"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것이 다른 신명칭과 유사하며, "yahwi-" 또는 더 정확하게는 "yawi"는 "pa'al"에서 "그는 될 것이다"를 의미하는 어근 "hwy"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한 학설에 따르면 "야훼"는 "엘(El)은 군대를 창조하는 자"라는 "ˀel ḏū yahwī ṣabaˀôt"의 축약형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크로스는 이것을 엘의 숭배 이름 중 하나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성경 안팎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어쨌든 두 신은 상당히 다르다. 엘은 노년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이며 야훼처럼 폭풍과 전투와 연관되지 않는다. 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야훼는 일반적으로 비능동적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YHWH는 YHYH로 번역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칭호를 축약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모든 종교에서 종교적 근대주의와 보수주의의 공존이 표준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이름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아멘호테프 3세(기원전 1390~1352년) 시대의 비문에 있는 이집트어 지명 "tꜣ šꜣsw Yhwꜣ", "야훼(YHWH)의 샤수(Shasu)의 땅"(tꜣ šꜣsw Yhwꜣ)이다. (이집트어: ''Yhwꜣ'') 샤수는 북아라비아의 미디안과 에돔 출신 유목민이었다. 지명 "yhwꜣ"와 신명 "YHWH"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6] 야훼는 세이르, 에돔, 바란 광야, 데만과 관련된 남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상당한 지지는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며, 이는 야훼가 어떻게 북쪽으로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많은 학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답은 케닌 가설로, 상인들이 고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대상 길을 따라 야훼를 이스라엘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야훼가 가나안에 없는 것, 성경 이야기에서 에돔과 미디안과의 관계, 그리고 모세의 케닌 또는 미디안과의 연관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지점을 연결하지만, 그 주요 약점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굳건히 뿌리를 두고 있었고, 모세의 역사적 역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케닌 가설을 유지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최초의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야훼(그리고 미디안/케닌인)를 만났다고 가정해야 한다. 크리스티안 프레벨(Christian Frevel)은 야훼의 남쪽 기원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예: "데만의 야훼")은 단순히 후대에 그곳에 존재했음을 나타낼 뿐이며, 데만은 유다를 포함한 어떤 남쪽 지역도 가리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7]
반대로 일부 학자들은 YHWH 숭배가 이스라엘 왕국의 토착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므리 왕조에 의해 유다 왕국에서 장려되었다고 주장한다.[7][8] 프레벨은 하자엘의 이스라엘 왕국 정복이 두 왕국이 협력하게 만들어 유다 일반 백성 사이에 YHWH 숭배가 퍼져나갔다고 제안한다. 이전에는 YHWH가 유다 국가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7]
이 이름이 구약성서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2장이며,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야훼(YHWH)는 인간의 창조주로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숭배되어 온 유일신으로 여겨진다.
한편, 성서 비평가들에 따르면, 유대교 성립 이전의 신앙을 야훼 신앙 또는 엘로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두 신앙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4원설에서는, 엘(일반 명사로서의 신을 의미) 또는 그 복수형인 엘로힘을 신의 호칭으로 하는 「E 자료」와 야훼를 신의 이름으로 하는 「J 자료」가 상정된다. 두 신앙은 상당히 성격이 다른 별개의 신앙 체계였으나, 유일신교화 과정에서 혼동되어 동일한 신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엘로힘은 야훼보다 더 오래된 신앙이며, 원래는 셈족 여러 민족에게서 볼 수 있는 다신교의 최고신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늘의 신이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나 갈릴리 등 북부 지역에서 숭배되었다. 이와는 달리, 야훼의 기원은 엘로힘의 기원보다 다소 시대적으로 뒤이며, 야훼는 추상적인 엘로힘과 달리 구체적인 인격신으로, 자애뿐만 아니라 분노와 질투(다른 신들에게로 향하는 백성의 마음을 질투로 표현함)도 표출하는 감정이 풍부한 신이었다. 원래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남부의 신앙이었고, 왕국 시대에는 엘로힘과 달리 야훼의 의례는 레위 지파 사제 계급이 담당하였다. 유일신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만, 유일신교화 시대를 더욱 오래 전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는데, 출애굽 당시의 히브리인은 고대 이집트의 아텐 신을 믿었고, 따라서 아텐 신앙이 폐지된 후 탄압받아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설도 있다.[92]
12. 기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는 야훼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12. 1. 마오리어
뉴질랜드의 마오리어에서는 고유명사가 아닌 "주"의 번역어로서 "ihowā"(이호와)가 사용된다.[93]12. 2. 신흥 종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는 야훼를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참조
[1]
harvnb
The strong consensus of biblical scholarship is that the original pronunciation of the name YHWH ... was Yahweh.
[2]
harvnb
... the pronunciation of the Ineffable Name was one of the climaxes of the Sacred Service: it was entrusted exclusively to the High Priest once a year on the Day of Atonement in the Holy of Holies.
[3]
bibleverse
[4]
harvnb
"There has been one key objection, by Michael Streck, who reevaluated Amorite personal names as a whole in 2000 and as part of this work published the separate conclusion (1999) that all the ''Ya-wi-'' and ''Ya-aḫ-wi-'' elements in these names must be understood to reflect the same root ''ḥwy'', "to live"....If Streck is correct that these are all forms of the verb "to live", then the Amorite personal names must be set aside as useful to any interpretation of the name [Yahweh]." But see
[5]
journal
Was Yahweh Originally a Creator Deity?
https://www.jstor.or[...]
1967-01-01
[6]
harvnb
"Unfortunately, albeit the interesting analogies, the learned discussions, and the broad perspective, the evidence is too scanty to allow any conclusions concerning the exact meaning of the term YHWA/YHA/YH as it appears in Ancient Egyptian records."
[7]
journal
When and from Where did YHWH Emerge? Some Reflections on Early Yahwism in Israel and Judah
2021-01-01
[8]
journal
God's Best 'Frenemy': A New Perspective on YHWH and Baal in Ancient Israel and Judah
https://www.academia[...]
2021-01-01
[9]
book
La fraternité de Jacob et d'Esaü (Gn 25–36): quel frère aîné pour Jacob?
https://books.google[...]
Labor et Fides
2009-01-01
[10]
book
Qos [in]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Pieter Willem van der Horst [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https://books.google[...]
Wm. B. Eerdmans Publishing
[11]
book
Identity in Conflict: The Struggle between Esau and Jacob, Edom and Israel
https://books.google[...]
Penn State Press
[12]
journal
Seals in Ancient Israel and the Near East: Their Manufacture, Use, and Apparent Paradox of Pagan Symbolism
https://www.academia[...]
2016-01-01
[13]
bibleverse
[14]
book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ism
Routledge
[15]
book
Judaism and Hellenism in Antiquity: Conflict or Confluenc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8-01-01
[16]
journal
Sabazius and the Jews in Valerius Maximus: a Re-examination
https://www.cambridg[...]
1979-11-01
[17]
book
Roman Republican Moneyers and Their Coins, 63 B.C.–49 B.C.
https://books.google[...]
Seaby
[18]
book
Satires and Judeophobia: Attitudes toward the Jews in the Ancient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19]
book
frg. 37.2 and Judeophobia
[20]
book
Epitome and The Great Mosque of Damascus: Studies on the Makings of an Umayyad Visual Culture
Brill
[21]
website
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ヤハウェ」の解説
https://kotobank.jp/[...]
2022-06-05
[22]
website
ヤハウェ
https://kotobank.jp/[...]
[23]
book
広辞苑
[24]
book
新共同訳 聖書辞典
新教出版社
[25]
website
平凡社『世界大百科事典』第2版「ヤハウェ」の解説
https://kotobank.jp/[...]
2022-06-22
[26]
book
新共同訳 聖書辞典
キリスト新聞社
[27]
book
旧約聖書の誕生
ちくま学芸文庫
[28]
dictionary
אדני
[29]
website
אדני(Lord)-Genesis 15:8
http://interlinearbi[...]
[30]
website
אדני(my master)-Genesis 24:35,אדני(my master's)-Genesis 24:36,אדני(is my master)-Genesis 24:65
http://interlinearbi[...]
[31]
website
H113 adon
//biblehub.com/hebre[...]
[32]
website
H113 'adown
//biblestudytools.co[...]
[33]
website
H113 'adown
//biblestudytools.co[...]
[34]
문서
原文まま。正しくは歴史的仮名遣で「ヱホバ」。
[35]
book
新改訳聖書 あとがき
[36]
서적
日本聖公会祈祷文訂正委員報告
NDLDC
1893
[37]
문서
英語圏ユダヤ教徒用英訳
[38]
문서
エローヒーム、エロヒームの読み方
[39]
문서
上帝版聖書と神版聖書の歴史
[40]
문서
大文字で始まることへの注意
[41]
서적
ゴッドと上帝
筑摩書房
1986
[42]
서적
ブリッジマン・カルバートソン訳『舊約全書』
http://www.meijigaku[...]
江蘇滬邑美華書館
1863
[43]
서적
ブリッジマン・カルバートソン訳『新約全書』
http://www.meijigaku[...]
上海美華書局
1863
[44]
서적
ゴッドと上帝
筑摩書房
1986
[45]
서적
ゴッドと上帝
筑摩書房
1986
[46]
문서
ヘブライ語の表記方向
[47]
서적
ヘブライ文字の第一歩
[48]
간행물
ハーザー
2011-01
[49]
서적
Clementis Alexandrini Opera
https://archive.org/[...]
Clarendon Press
1869
[50]
서적
Panarion
iarchive:patrologiae[...]
[51]
서적
Experiencing God: Theology as Spirituality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2
[52]
간행물
旧約聖書誌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1963
[53]
간행물
聖書文献ジャーナル誌
[54]
서적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추가 정보 필요)
[55]
문서
이슬람의 신 "알라"와 이집트의 태양신 "라"에 대한 설명
(추가 정보 필요)
1994
[56]
서적
中公バックス 世界の名著 13 聖書
[57]
웹사이트
Yahwehの発音の仕方
https://ja.howtopron[...]
[58]
웹사이트
文語訳 小型聖書
http://www.bible.or.[...]
日本聖書協会
[59]
웹사이트
宗教年鑑 平成24年版
http://www.bunka.go.[...]
文化庁
2012
[60]
웹사이트
http://textus-recept[...]
[61]
웹사이트
参照資料付き新世界訳聖書付録1ニ クリスチャン・ギリシャ語聖書中の神のみ名
http://wol.jw.org/ja[...]
ものみの塔聖書冊子協会 (エホバの証人)
1985
[62]
서적
神のみ名
http://kln.ne.jp/jeh[...]
びぶりや書房 (現 ビブリア書房)
2007-11
[63]
서적
Essays on the Semitic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Eerdmans Pub Co
1997-12-01
[64]
간행물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聖書文献ジャーナル誌英語
https://www.jstor.or[...]
[65]
문서
신세계역 성경과 다른 성경 번역본의 비교 분석
[66]
문서
George Howard와 P. E. Kahle의 테트라그라마톤 관련 논문에 대한 비판적 고찰
[67]
간행물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聖書文献ジャーナル誌英語
https://www.jstor.or[...]
[68]
간행물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聖書文献ジャーナル誌英語
https://www.jstor.or[...]
[69]
서적
Tetragrammaton: Western Christians and the Hebrew Name of God
https://brill.com/vi[...]
Leiden: Brill
2015-02-04
[70]
서적
Tetragrammaton: Western Christians and the Hebrew Name of God: From the Beginnings to the Seventeenth Century.
https://brill.com/vi[...]
Leiden: Brill
2015-02-04
[71]
웹사이트
Writing & Pronouncing the Divine Name in Second-Temple Jewish Tradition
https://larryhurtado[...]
Larry Hurtado's Blog
2022-06-05
[72]
서적
De Septuaginta: Studies in Honour of John William Wevers on His Sixty-Fifth Birthday
http://homes.chass.u[...]
Mississauga, Ont., Canada : Benben Publications
[73]
웹사이트
The Divine Name and Greek Translation
https://larryhurtado[...]
Larry Hurtado's Blog
2013-07-03
[74]
학술지
The Reading and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i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e Greek Pentateuch
2007-06-01
[75]
학술지
The Reading and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i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e Greek Pentateuch
2007-06-01
[76]
학술지
The Reading and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i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e Greek Pentateuch
2007-06-01
[77]
학술지
The Reading and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i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e Greek Pentateuch
2007-06-01
[78]
학술지
The Reading and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i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e Greek Pentateuch
2007-06-01
[79]
학술지
The Reading and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i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e Greek Pentateuch
2007-06-01
[80]
학술지
The Reading and Translation of the Divine Name i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e Greek Pentateuch
2007-06-01
[81]
간행물
参照資料付き新世界訳聖書付録1ニ クリスチャン・ギリシャ語聖書中の神のみ名
http://wol.jw.org/ja[...]
ものみの塔聖書冊子協会 (エホバの証人)
[82]
학술지
The god Iao and his connection with the Biblical Go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manuscript 4QpapLXXLevb ("Ο θεός Ιαώ και η σχέση του με τον Βιβλικό Θεό, με ιδιαίτερη εστίαση στο χειρόγραφο 4QpapLXXLevb")
https://www.academia[...]
[83]
웹사이트
is-Jesus-Yahweh
https://www.gotquest[...]
2024-11-06
[84]
웹사이트
司教協議会への手紙――「神の名」について
http://www.cbcj.cath[...]
カトリック中央協議会
[85]
서적
信仰の手引き
新教出版社
[86]
서적
組織神学
聖書図書刊行会
[87]
서적
改革派神学通論
活水社書店
[88]
서적
キリスト教信仰の基礎
聖書図書刊行会
[89]
종교경전
クルアーン
[90]
종교경전
クルアーン
[91]
종교경전
クルアーン
[92]
서적
モーセと一神教
[93]
문서
神よニュージーランドを守り給え (マオリ語版)
[94]
서적
Appendix: Monotheism and Polytheism in Ancient Isr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95]
서적
Kuntillet ‘Ajrud and the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Routledge
[96]
백과사전
Cult Places, Israelite
https://www.encyclop[...]
Encyclopaedia Judaica; Encyclopedia.com
2022-04-25
[97]
웹사이트
Jehovah (Yahweh)
http://www.newadvent[...]
[98]
문서
הַ־ (ha, “the”) + שֵׁם (shem, “name”)
[99]
웹사이트
Yahweh (Bible)
http://www.britannic[...]
[100]
웹사이트
Bartleby.com: Great Books Online - Quotes, Poems, Novels, Classics and hundreds more
http://www.bartleby.[...]
2010-07-17
[101]
서적
Understanding the Bible
Mayfield
[102]
백과사전
Some scholars, on the strength of Ex., xviii, go even so far as to assert that it was from Jethro that the Israelites received a great portion of their monotheistic theology.
Catholic Encyclopedia
[103]
학술지
The Midianite-Kenite Hypothesis Revisited and the Origins of Judah
[104]
서적
[105]
웹사이트
George Aaron Barton (1859–1942), US Bible scholar and professor of Semitic languages.
[106]
논문
The rise of Yahwism : role of marginalised groups
University of Pretoria
2016-06-24
[107]
간행물
The Archaeology of Cult of Ancient Israel’s Southern Neighbors and the Midianite-Kenite Hypothesis
2021
[108]
간행물
Reading Northwest Semitic Inscriptions
https://www.academia[...]
2007
[109]
간행물
The Archaeology of Cult of Ancient Israel’s Southern Neighbors and the Midianite-Kenite Hypothesis
202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