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략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위략은 위나라 말기부터 서진 초기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서로, 유환이 저술했다. 위나라와 후한 말 군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고조선, 삼한, 대진국(로마 제국) 등 외국에 대한 당시 문헌 중 가장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한 기록은 중국 측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료로 평가받으며, 원로원의 존재를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위략은 야마타이국(왜)에 대한 기록도 풍부하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지기는 내용의 번잡함을 비판했지만, 고사손은 특별한 기록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3세기 역사책 - 삼국지
진수가 쓴 《삼국지》는 위, 촉, 오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역사서로, 위지, 촉지, 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대에 《삼국지연의》에 영향을 주고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 3세기 역사책 - 영웅기
영웅기는 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한 항목이다. - 삼국지 - 태평도
태평도는 장각이 창시한 도교 종파로, 《태평청령서》를 기반으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교세를 확장하여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고, 이후 쇠퇴했지만 도교에 영향을 미쳤다. - 삼국지 - 화양국지
화양국지는 상거가 편찬한 지방지로, 파, 한중, 촉, 남중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를 기록하고 후한부터 성한 시대까지의 역사와 인물 열전을 담아 고촉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중국 최고(最古)의 지리지 중 하나이다. - 중국의 역사책 - 자치통감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은 기원전 403년부터 959년까지 1362년간의 중국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294권의 방대한 편년체 역사서로, 통치자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정치적 교훈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각과 사마광의 역사관을 담아 송대 이후 역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중국의 역사책 - 춘추좌씨전
《춘추좌씨전》은 춘추 시대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춘추 시대의 사건들을 노나라의 관점에서 서술하며, 문학적 가치 또한 높이 평가받는다.
| 위략 | |
|---|---|
| 개요 | |
| 제목 (원제) | 魏略 (웨이략) |
| 저자 | 위환 |
| 집필 시기 | 3세기 |
| 언어 | 한문 |
| 종류 | 사서 (史書) |
| 내용 |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 |
| 현존 여부 | 원본은 소실, 주석 및 인용으로 일부 내용만 전존 |
| 특징 | |
| 내용 특징 | 서역에 대한 상세한 기록 대진국 (로마 제국)에 대한 기록 왜에 대한 기록 |
| 사료 가치 | 삼국지 배송지 주석의 중요한 인용 자료 중국사 연구의 중요 자료 서양사 연구의 중요 자료 일본사 연구의 중요 자료 |
| 구성 | |
| 내용 구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물 외교 (특히 서역과의 관계) |
2. 편찬과 성격
『위략』(魏略)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역사를 다룬 사찬 역사서로, 어환(魚豢)이 저술했다. 정확한 편찬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위나라 말기에서 서진 초기로 추정된다.[6] 이는 유지기(劉知幾)가 명제 때까지의 기록이라고 한 것과 달리, 감로 2년(257년) 이후의 기록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위나라나 진나라 황제 및 중요 인물의 휘를 피하지 않고 사용한 점도 특징이다.
『위략』은 어환의 또 다른 저서인 『전략(典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고대부터 위나라까지를 다룬 통사인 『전략』의 일부였으나, 위나라 부분만 독립하여 『위략』이 되고 나머지가 『전략』으로 남았다는 설이 유력하다.
내용 면에서는 위나라와 후한 말 군벌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며, 특히 외국에 대한 기록은 당시 문헌 중 가장 자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반도의 고조선과 삼한에 대한 기록은 사기 등 기존 사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주며, 위만 조선 이전 고조선의 역사와 준왕의 남하, 왕족의 성씨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야마타이국이나 로마 제국(대진국)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로마에 대해서는 중국 측 기록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료 중 하나로, 로마 원로원의 존재를 시사하는 등 독특한 내용을 전한다. 이러한 서역 관련 기록은 배송지가 『삼국지 주(三國志注)』에 위략의 「서융전」을 대거 인용하면서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
『위략』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서, 유지기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번잡하다고 비판했지만, 고사손은 특별한 필력이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7]
2. 1. 편찬 시기에 대한 여러 설
위나라 말기부터 진나라 초기로 추정되는 위략(魏略)의 정확한 편찬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한다. 유지기(劉知幾)는 위략의 기록이 위 명제(魏明帝) 시대에서 멈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의 기록도 확인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후대의 기록은 『삼국지』 가규전(賈逵傳) 주석에 인용된 감로 2년(257년)의 기사이다.[6] 이 시점 이후에 책이 완성되었는지, 혹은 저술이 중단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징적인 점은 위략이 위나라와 진나라 황제 및 중요 인물들의 휘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이다.또한, 저자 어환(魚豢)의 다른 저서인 『전략』(典略)과 위략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다. 『수서』 경적지(經籍志)에는 『전략』이 89권으로 기록된 반면, 『구당서』 경적지에는 『위략』 38권과 『전략』 50권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요진종(姚振宗)은 『수서』에 기록된 『전략』 89권이 실제로는 『구당서』의 『위략』 38권과 『전략』 50권을 합한 것(총 88권)이며, 원본에 목록 1권이 포함되어 89권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위략이 본래 『전략』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종원(章宗源)은 "위략은 오직 조위(曹魏)만을 기록했기에 서명에 '위(魏)'를 사용한 것"이며, "『전략』은 기록 범위가 넓고 체재도 잡다하여 위략과는 다른 시대를 다룬 책"이라고 주장하며, 위략을 위나라 왕조사로, 전략을 그 외 왕조 및 이전 시대를 다룬 역사서로 구분했다. 이 두 설을 종합해 보면, 본래 중국 고대부터 위나라까지를 다룬 통사(通史)로서 『전략』이 존재했으나, 그중 위나라 관련 부분만 독립하여 『위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전략』으로 남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2. 전략(典略)과의 관계
어환의 또 다른 저서인 『전략(典略)』과의 관련성이 지적된다. 『수서』 경적지(經籍志)에는 『전략』이 89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구당서』 경적지에는 『위략』 38권과 『전략』 50권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이에 대해 요진종(姚振宗)은 『수서』에 기록된 『전략』 89권이 실제로는 『구당서』의 『위략』 38권과 『전략』 50권을 합한 것이라고 보았다. 두 책을 합하면 88권이 되는데, 1권의 차이는 원서에 목록 1권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정하며, 『위략』이 본래 『전략』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종원(章宗源)은 『위략』은 오직 조위(曹魏) 시대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서명에 '위(魏)'를 사용했으며, 『전략』은 그보다 기록 범위가 넓고 내용도 다양하여 위나라 이전의 다른 왕조들까지 포괄하는 역사서라고 주장했다. 즉, 『위략』은 조위 왕조사, 『전략』은 그 외 시대를 다룬 책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설을 종합해 보면, 원래 어환은 고대부터 조위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는 통사(通史)로서 『전략』을 저술했으나, 이후 위나라에 관한 기록만을 분리하여 『위략』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전략』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 3. 내용의 특징
위략은 위나라 및 후한 말기 군벌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의 일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생생한 증언을 중시하여 기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러나 외국에 관한 기술은 현존하는 당시 문헌 중 가장 자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고조선, 삼한, 야마타이국, 그리고 대진국(大秦國, 로마 제국)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에 있었던 고조선에 대해서는, 사기가 위만이 건국한 위만 조선 이전의 고조선 존재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달리, 위략은 연나라 때 고조선 국왕이 왕을 칭하려 하자 대부 예(禮)가 이를 말렸던 일화, 부왕의 치세, 위만에게 쫓겨난 준왕의 기록, 그리고 고조선 왕족의 성씨가 한씨(韓氏)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하였다.
로마 제국(대진국)에 대한 기록은 중국 측 사료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으며, 중국의 황제 중심 체제와는 다른 로마 원로원의 존재를 시사하는 기술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서역(西域) 제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배송지가 『삼국지 주(三國志注)』 제30권의 주석으로 위략의 「서융전(西戎傳)」 거의 전부를 인용하면서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다.[1] 이 「서융전」은 후한 시대 서역의 사정을 충실하게 담고 있어, 범엽의 『후한서』보다 앞서는 후한대 서역 관련 기록으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위략의 정보 중 일부는 로마 제국 상인 등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한 왕조 말기 이후에도 조위 시대까지 서방과의 육상 교류가 비교적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226년 교지에 도착하여 동오의 손권에게 로마에 대한 정보를 보고한 로마 상인의 기록(『양서(梁書)』) 등도 위략의 정보 출처 중 하나였을 수 있다.
또한 위략에는 로마 제국의 종속국으로 추정되는 "제산(Zesan)"[2][3]이나, 인도 남동쪽에 위치했다고 기록된 "반월(Panyue)" 또는 "한월왕(Hanyuewang)"[4]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과 왕국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중국의 서방 세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위략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유지기는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싣고, 내용이 매우 많다"라며 내용의 번잡함을 비판했지만, 고사손은 "특히 필력이 있다"라고 높게 평가하였다.[7]
2. 4. 평가
유지기는 『위략』에 대해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실어 매우 번잡하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고사손은 "특별한 기록이 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7]3. 위략에 기록된 외국
『위략』에는 당시 중국 주변의 여러 외국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 삼국시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및 인식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특히 야마타이국 시대의 왜국에 관한 기술이 비교적 상세하게 남아 있어, 고대 일본사 및 한일 관계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1] 또한, 『위략』은 로마 제국(당시 중국 명칭: 대진국)이나 인도(천축) 등 서방 세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3. 1. 야마타이국 (왜)
『위략』에는 야마타이국 시대의 왜국에 관한 기술이 많이 남아 있어, 야마타이국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왜국에 관한 이문(逸文)은 『삼국지』 배주(裴注), 『한서』 사고주(師古注), 『한원』, 『북호록』, 『위서』, 『법원주림』 등 여러 문헌에 남아 전해진다.이 기록들에는 당시 왜인의 풍속이나 스스로 태백의 후손이라 칭했다는 출자(出自)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1. 1. 왜인의 풍속
> 그 풍속은 정세사절(正歳四節)을 알지 못하고, 다만 봄의 경작과 가을의 수확을 헤아려 연기로 삼는다.
이 기록에 대해, 봄의 경작부터 가을의 수확까지를 한 해로 계산하여 현대의 반년을 1년으로 삼았다는 해석이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봄에 밭을 갈고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대략 1년으로 여겼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 기록만으로 사서에 나타난 연수를 두 배로 늘려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또한, 『한원』 권30에 인용된 『위략』의 이문에는 왜인의 유래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 自帯方至女國万二千余里 其俗男子皆黥而文 聞其旧語 '''自謂태백之後''' 昔夏后小康之子 封於会稽 断髪文身 以避蛟龍之害 今倭人亦文身 以厭水害也중국어
이에 따르면 왜인들은 스스로 태백(太伯)의 후손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또한 문신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과거 회계에 봉해진 하나라 소강의 아들이 교룡의 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몸에 문신을 했던 것과 같이 물의 재앙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1. 2. 왜인의 출자
『한원』 권30의 이문에는 왜인의 출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왜인들은 스스로 태백의 후손이라고 칭했다고 한다.[1]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自帯方至女國万二千余里 其俗男子皆黥而文 聞其旧語 '''自謂태백之後''' 昔夏后小康之子 封於会稽 断髪文身 以避蛟龍之害 今倭人亦文身 以厭水害也중국어
이는 대방에서 왜의 여왕국까지의 거리와 함께, 남자는 모두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한다는 풍속을 전하며, 옛 이야기에서는 스스로 태백의 후예라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하나라 소강의 아들이 회계에 봉해져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여 교룡의 해를 피했는데, 지금의 왜인 역시 문신을 하여 물의 재앙을 피하려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1]
3. 2. 로마 제국 (대진국)
유환(游渙)이 저술한 『위략(魏略)』은 원본이 소실되었으나, 서융(西戎)에 관한 장(章)의 내용이 배송지(裴松之)가 429년에 편찬한 『삼국지 주(三國志注)』 제30권에 인용되어 현재까지 전해진다.[1] 『위략』은 현존하는 중국 측 문헌 가운데 로마 제국(당시 중국 명칭: 대진(大秦))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유환은 직접 중국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파르티아, 인도, 그리고 로마 제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했다. 이 정보 중 일부는 동한(東漢) 왕조 시기 로마 제국 상인들이나 외국 선원들을 통해 중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동한 말기부터 조위(曹魏) 시대까지 서방과의 육상 교류는 비교적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위략』에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의 '서역(西域)' 관련 기록처럼 이전 시대의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략』의 중요한 가치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의 새롭고 독특하며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서방 세계, 특히 로마 제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대부분 동한 시대 후반, 내전과 국경 불안으로 중국과 서방의 교류가 잠시 단절되기 전에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3. 2. 1. 로마 제국으로 가는 경로
유환(游渙)이 저술한 『위략(魏略)』은 원본이 사라졌지만, 서융(西戎)에 관한 장은 배송지(裴松之)가 『삼국지 주(三國志注)』 제30권에 인용한 덕분에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1] 유환은 직접 중국을 벗어난 적은 없지만, 파르티아, 인도, 그리고 로마 제국 (대진(大秦))을 포함한 서쪽 나라들과 그곳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다.이 정보 중 일부는 로마 제국 상인들을 통해 중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동한(東漢) 왕조 말기부터 조위(曹魏) 시대까지 서방과의 육상 교류는 비교적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략』에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의 '서역(西域)' 관련 기록처럼 이전 시대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만,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의 새롭고 독특하며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담고 있어 중요한 역사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새로운 정보는 대부분 동한 시대 후반, 내전과 국경 불안으로 중국과 서방의 교류가 잠시 끊기기 전에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략』은 로마 제국으로 가는 경로를 설명하는데, 이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는 외국 선원들로부터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양서(梁書)』에는 226년 교지(交趾)(현대 하노이 근처)에 도착한 로마 제국 상인이 동오(東吳) 황제 손권(孫權)의 궁정으로 보내져 로마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유환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했을 수 있다.
또한 『위략』은 로마 제국의 종속국으로 "제산(Zesan)"이라는 곳을 간략히 언급한다. 존 E. 힐은 이곳을 동아프리카 해안의 아자니아(Azania)로 보았으나[2], 『구당서(舊唐書)』 등 후대 기록에서 "제산"이 로마 제국의 북동쪽에 위치한다고 전하고 있어, 트레비존드(Trebizond)일 가능성도 제기된다.[3]
더불어 『위략』은 인도 남동쪽에 위치한 "반월(Panyue)" 또는 "한월왕(Hanyuewang)"이라는 왕국을 언급한다. 힐은 이를 타밀라캄(Tamilakam)의 판디아(Pandya) 왕국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반월(판디아) 왕국은 한월왕이라고도 불린다. 천축(북부 인도)의 남동쪽으로 수천 리) 떨어져 있으며, 익부(益部) [현대 남부 윈난(雲南)]과 접촉하고 있다. 주민들은 키가 작아 중국인과 비슷하다. 촉(蜀) (쓰촨(四川) 서부) 상인들이 이곳까지 여행한다."[4] 그는 "익부와 접촉하고 있다"(與益部相近)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익부와 가깝다"로 해석할 경우, 벵골의 푼드라바르다나(Pundravardhana)가 "반월"의 후보지가 될 수도 있다.
3. 2. 2.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
(작성할 내용 없음 -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관련 정보가 부재함)3. 2. 3. 로마 제국의 속국
『위략(魏略)』에는 로마 제국의 종속국으로 "제산(Zesan)"이라는 곳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학자 존 E. 힐(John E. Hill)은 이 "제산"을 동아프리카 해안의 아자니아(Azania)로 보았다.[2] 그러나 『구당서(舊唐書)』와 같은 후대의 중국 기록에서는 "제산"이 로마 제국의 북동쪽에 위치한다고 전하고 있어, 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후대 기록에 근거하여 "제산"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트라브존에 해당하는 트레비존드(Trebizond)일 가능성이 제기된다.[3]3. 3. 인도 (천축)
『위략』에는 인도 남동쪽에 위치한 盤越|반월중국어(Panyue영어) 또는 "한월왕"(Hanyuewang영어)이라는 왕국이 언급되어 있다. 존 E. 힐은 이 왕국을 타밀라캄( Tamilakam영어 )의 판디아 왕국( Pandya영어 )과 동일시하며, 『위략』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반월(판디아) 왕국은 한월왕이라고도 불린다. 천축 (북부 인도)의 남동쪽으로 수천 리 떨어져 있으며, 익부(益部) [현대 남부 윈난성]과 접촉하고 있다. 주민들은 작으며, 키는 중국인과 같다. 촉(蜀) [현대 쓰촨성] 상인들이 여기까지 여행한다. 남쪽 경로는 가장 서쪽 지점에 도달한 후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끝에 이른다."[4]
힐은 與益部相近|여익부상근중국어 구절을 익부와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익부와 가깝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반월"은 벵골 지역의 푼드라바르다나( Pundravardhana영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4.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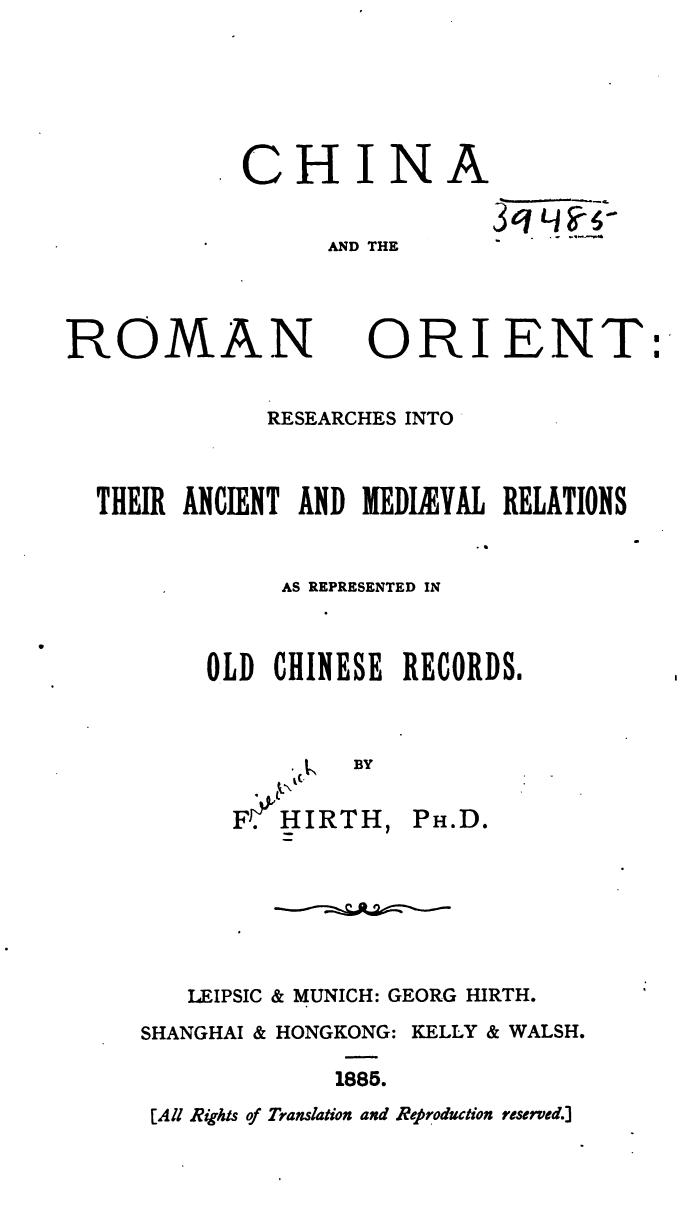
''위략'' 중 대진(로마 영토)에 관한 부분은 프리드리히 히르트가 1885년에 출판한 선구적인 저서 ''중국과 로마 오리엔트''(China and the Roman Orient)에서 영어로 번역되었다. 히르트는 이 책에서 대진과 관련된 다양한 다른 중국 문헌의 번역과 각 문헌의 중국어 원문도 함께 실었다.
1905년에는 에두아르 샤반느가 ''위략''의 나머지 부분을 Les pays d'occident d'après le Wei liofra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샤반느의 번역에는 방대한 주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 육상 무역로의 동쪽 구간에서 ''위략''에 언급된 많은 국가와 도시를 설득력 있게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참조
[1]
서적
Annotated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Dingwen Printing
[2]
기타
[3]
기타
New Book of Tang
[4]
기타
[5]
기타
呉書
[6]
기타
[7]
기타
史略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