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양암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서울 안양암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안양암 명부전에 모셔진 지장삼존상과 시왕상 18구를 포함하는 불교 조각상 일괄이다. 지장삼존상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상과 무독귀왕상으로 구성되며, 시왕상은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묘사한다. 1941년에 제작된 지장보살상을 비롯하여, 20세기 초 시왕상의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로 평가되어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시왕상 -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
1654년에 조성된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시왕상 일괄은 벽암각성의 문도들이 불사를 주도하고 조각승 해심을 비롯한 15명의 장인이 참여하여 제작되었으며, 조각적 완성도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다. - 시왕상 -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657년에 인영, 탄준, 지변 등이 제작한 23구의 불상으로, 지장보살좌상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으로 구성된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 귀왕, 판관, 인왕, 범천·제석천상 등을 포함하며 청곡사 업경전에 봉안되어 있다. - 지장보살 - 김교각
김교각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당나라 구화산에서 수행하며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숭배받는 인물이지만, 실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설화적 인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 지장보살 - 지장보살본원경
지장보살본원경은 실차난타가 번역한 불교 경전으로, 지장보살이 중생을 지옥에서 구제하는 방법과 업보, 효, 보편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경전 독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한다. - 서울특별시의 문화유산자료 - 구 탑골공원 정문
구 탑골공원 정문은 1910년에서 1913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탑골공원의 옛 정문으로, 1967년 현재의 한식 정문으로 교체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문을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의 정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1 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지켰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서울특별시의 문화유산자료 - 경국대전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72호)
경국대전 (서울시 문화재자료 제72호)은 1485년 완성된 조선 시대 법전 《경국대전》의 내용을 담은 1668년 평안도 판본으로, 완전한 형태의 희귀한 동일본이라는 점에서 서지학 및 법제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2. 지장삼존상
안양암 명부전 중앙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배치한 지장삼존상이 모셔져 있다. 지장보살상은 나무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상은 소조로 만들어졌다.[1]
2. 1. 지장보살상
서울 안양암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의 지장보살상은 승형(僧形)의 머리에 방형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으며, 이목구비가 단정하다. 어깨는 넓고 둥글어 장대한 느낌을 준다. 오른손은 가슴 부근에서 엄지와 중지를 굽혔고, 왼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고 보주를 들고 있다. 다리는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다리 앞에는 삼각형 옷자락이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 있다.[1]2. 2. 도명존자상
꽃무늬 있는 빨간 옷깃에 옥색 내의, 붉은 가사를 걸치고 있으며, 고개를 약간 든 채 두 손으로 석장(錫杖)을 힘차게 잡고 있다.[1]2. 3. 무독귀왕상
무독귀왕상은 옥색 옷깃에 꽃무늬가 화려한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며, 시왕과 같은 형태의 관을 쓰고 두 손으로 금색 경궤(經机)를 들고 있다. 좌우 협시상은 화려한 채색이 두드러진다.[1]2. 4. 조성 연대 및 의의
안양암 명부전에 있는 지장삼존상은 1941년 화경(和鏡)이 제작한 것으로, 《안양암지(安養庵誌)》에 기록되어 있다.[1] 제작 연대는 비교적 최근이지만, 20세기 초 지장삼존상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1]3. 시왕상 일괄
안양암 명부전의 시왕상은 지장보살 좌우로 각 9구씩, 총 18구가 배치되어 있다. 시왕은 명부(冥府)에서 망자(亡者)를 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의미한다.[1] 각 시왕상은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시왕상과 함께 배치된 판관, 인왕, 동자상 역시 각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판관상은 두루마리나 명부를 들고 있고, 인왕상은 무기를 들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동자상은 원래 10구가 한 세트지만 현재는 4구만 남아있다.[1]
이처럼 시왕상과 권속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며, 서울에서는 안양암과 진관사에만 남아 있다. 따라서 안양암 시왕상은 20세기 초 시왕상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춘 귀중한 예로 평가받고 있다.[1]
3. 1. 시왕상의 배치
안양암 명부전 시왕상은 중앙의 지장삼존상 좌우로 각 9구씩 모두 18구가 배치되어 있다.[1]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시왕은 죽은 뒤의 세계인 명부(冥府)에서 망자(亡者)를 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말한다. 안양암 명부전 시왕상의 세부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판관상은 향우측과 향좌측에 각각 1구씩 배치되어 있다. 향우측 판관상은 사모를 쓰고 검은색 옷깃이 둘러진 주황색 관복을 입고 두 손으로 두루마리 2개를 받쳐 들고 있다. 향좌측 판관상은 사모를 쓰고 주황색 옷깃이 둘러진 옥색 관복을 입고 왼손은 옷자락 속에 감추고 오른손으로 명부를 잡고 있다.[1]
인왕상은 판관상 옆에 배치되어 있다. 향우측 인왕상은 눈을 부릅뜨고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향좌측 인왕상은 눈을 부릅뜨고 입을 꾹 다문 채 오른손으로 긴 몽둥이를 들고 왼팔을 하늘 높이 쳐들고 있다.[1]
동자상은 원래 10구가 한 세트지만 현재는 좌우 각각 2구씩 4구만 남아있다. 세부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처럼 시왕상과 권속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에서는 안양암과 진관사에만 이러한 시왕상과 권속이 남아 있다.[1]
3. 2. 각 시왕상의 특징
안양암 명부전 시왕상은 중앙의 지장삼존상 좌우로 각 9구씩 모두 18구가 배치되어 있다. 향좌측에는 제2·4·6·8·10대왕과 업경대(業鏡臺)를 들고 있는 동자 1구, 동녀 1구, 판관 1구, 인왕상 1구가 있고, 향우측에는 제1·3·5·7·9대왕과 동자 1구, 동녀 1구, 판관 1구, 인왕상 1구가 배치되어 있다.[1]시왕은 죽은 뒤의 세계인 명부(冥府)에서 망자(亡者)를 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말한다. 각 시왕은 고유의 복식과 지물을 지니고 있으며, 담당하는 심판 내용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안양암 명부전 시왕상은 제1왕 진광대왕, 제3왕 송제대왕, 제5왕 염라대왕, 제7왕 태산대왕, 제9왕 도시대왕이 향우측에, 제2왕 초강대왕, 제4왕 오관대왕, 제6왕 변성대왕, 제8왕 평등대왕, 제10왕 오도전륜대왕이 향좌측에 배치되어 있다.[1]
판관상은 향우측과 향좌측에 각각 1구씩 배치되어 있는데, 향우측 판관상은 머리에 사모를 쓰고 검은색 옷깃이 둘러진 주황색 관복을 입은 채 두 손으로 두루마리 2개를 받쳐 들고 있다. 향좌측 판관상은 주황색 옷깃이 둘러진 옥색 관복을 입은 채 왼손은 옷자락 속에 감추고 오른손으로 명부를 잡고 있다.[1]
인왕상은 판관상 옆에 각각 1구씩 배치되어 있다. 향우측 인왕상은 눈을 부릅뜨고 오른손으로 칼을 쥐고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향좌측 인왕상은 눈을 부릅뜨고 입을 꾹 다문 채 오른손으로 긴 몽둥이를 들고 왼팔을 하늘로 쳐들고 있다.[1]
동자상은 원래 10구가 한 세트지만 현재는 좌우에 각각 2구씩 4구만 남아있다. 향좌측에는 업경(業鏡)을 들고 있는 동자상과 비녀로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잔과 주전자를 든 동녀상이 있다. 향우측에는 업경을 잡고 있는 동자상과 부인상 같이 머리를 틀어 올려 장식 띠로 묶고 복숭아를 들고 있는 동녀상이 있다.[1]
이와 같이 시왕상과 권속이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에서는 안양암과 진관사에만 이러한 시왕상과 권속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안양암 시왕상은 20세기 초의 시왕상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귀중한 예로 평가받아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1]
3. 2. 1. 제1대왕 진광대왕상
진광대왕(秦廣大王)은 시왕 중 첫 번째 왕으로, 죽은 후 7일째 되는 날에 중생들의 죄업을 다스리는 일을 관장한다고 한다. 진광대왕상은 머리에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녹색 옷깃에 꽃무늬로 장식된 붉은 공복을 입은 채 두 손을 가슴 위로 올려 명부를 잡고 있는 진광대왕 특유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1]3. 2. 2. 제2대왕 초강대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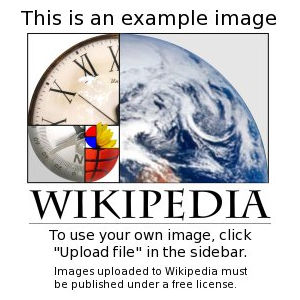
초강대왕상은 시왕 중 두 번째 왕으로 초강(初江) 가에 관청을 세우고서 죽은 지 14일째 되는 중생들의 도하(渡河)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초강대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머리에 면류관(冕旒冠)을 쓰고 남색 옷깃에 꽃무늬로 장식된 황색 공복을 입은 채 두 손은 가슴 위로 올려 홀(笏)을 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1]
3. 2. 3. 제3대왕 송제대왕상
송제대왕상은 죽은 이의 삼칠일(三七日)을 관장하는 왕으로, 대지옥 안에 별도의 16지옥을 두고 죄의 경중을 가려 죄인을 각각의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맡고 있다. 초강대왕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미간을 약간 찌푸린 채 두 손은 가슴 위로 올려 홀(笏)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1]3. 2. 4. 제4대왕 오관대왕상
제4대왕 오관대왕상은 죽은 이의 사칠일(四七日)에 그 죄업의 경중을 업칭(業秤)에 달아 오형(五刑)을 가하는 오관대왕(五官大王)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머리에는 원유관을 쓰고 붉은색 옷깃이 둘러진 남색 공복을 입은 채 두 손으로는 홀(笏)을 들고 있다.[1]3. 2. 5. 제5대왕 염라대왕상
제5대왕상 염라대왕상은 죽은 이의 오칠일(五七日)에 업경에 생전의 죄를 비추어 벌을 주는 염라대왕을 형상화한 것이다. 원유관 위에 경전을 이고 두 손으로는 무릎 위에 펼쳐진 명부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1]3. 2. 6. 제6대왕 변성대왕상
變成大王중국어상(變成大王像)은 죽은 이의 육칠일(六七日)에 오관대왕과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도 죄가 남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 벌을 받게 하는 변성대왕을 형상화한 것이다. 원유관을 쓴 채 두 손으로 배 앞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1]3. 2. 7. 제7대왕 태산대왕상
태산대왕상(泰山大王像)은 죽은 이의 칠칠일(七七日)에 천, 인, 아수라, 귀신, 축생, 지옥 등의 6도에서 망자(亡者)의 죄업에 따라 생처(生處) 혹은 지옥에 보내는 일을 관장하는 태산대왕(泰山大王)을 형상화한 것이다. 안양암 명부전의 태산대왕은 염라대왕과 같이 면류관을 쓰고 주황색 옷깃에 꽃무늬가 장식된 남색의 공복을 입은 채 두 손은 배 앞에서 모아 홀(笏)을 들고 있다.[1]3. 2. 8. 제8대왕 평등대왕상
제8대왕 평등대왕상은 죽은 사람의 100일째 일을 맡아보는 왕으로, 죄업을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뜻에서 평정왕(平正王)이라고도 불린다. 평등대왕은 머리에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붉은색 옷깃이 둘러진 옥색 공복을 입고 있으며, 두 손으로는 배 앞에서 홀(笏)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1]3. 2. 9. 제9대왕 도시대왕상
제9대왕상 도시대왕상(都市大王像)은 죽은 이의 1주기 일을 관장하는 왕인 도시대왕을 형상화한 것이다. 머리에 원유관을 쓰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는 명부를 펼쳐들고 있다.[1]3. 2. 10. 제10대왕 오도전륜대왕상
오도전륜대왕상은 죽은 이의 3주기 일을 맡고 있는 오도전륜대왕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망자는 죽은 후 여러 왕을 거치며 그 죄를 심판받고 최후로 오도전륜대왕 앞에 이르러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 받게 된다고 한다. 오도전륜대왕은 머리에 원유관을 쓰고 검은 색 옷깃이 둘러진 붉은 공복을 입은 채 두 손은 배 앞에서 홀(笏)을 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1]3. 3. 판관상
판관상은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은 채 두루마리나 명부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향우측의 판관상은 머리에 사모를 쓰고 검은색 옷깃이 둘러진 주황색 관복을 입고 두 손으로 두루마리 2개를 받쳐 들고 있다. 향좌측의 판관상은 머리에 사모를 쓰고 주황색 옷깃이 둘러진 옥색 관복을 입은 채 왼손은 옷자락 속에 감추고 오른손으로는 명부를 잡고 있다.[1]3. 4. 인왕상
인왕상은 판관상 옆에 1구씩 배치되어 있는데, 근육질 몸매에 무기를 들고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향우측의 인왕상은 눈을 부릅뜨고 오른손을 어깨 위로 올려 칼을 쥐고 무엇인가 내리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향좌측의 인왕상은 눈을 부릅뜨고 입을 꾹 다문 채 오른손은 내려 긴 몽둥이를 들고 왼팔은 하늘까지 번쩍 쳐들고 있다.[1]3. 5. 동자상
동자상은 원래 10구가 한 세트를 이루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안양암에는 좌우 각각 2구씩 총 4구만 남아있다. 향좌측에는 업경을 들고 있는 동자상이 제6대왕과 제8대왕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 쌍계형 머리를 하고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모아 큰 부채형의 업경을 잡고 있다.[1]향좌측의 동녀상은 제10왕 다음에 놓여 있는데, 머리는 비녀로 높이 틀어 올렸다. 오른팔은 어깨 위까지 올려 받침 있는 잔을 들었고 왼쪽 손목에 주전자를 걸치고 있다. 향우측에는 제5대왕과 제7대왕 사이에 업경을 잡고 있는 동자상이 있고, 제9상 다음에는 부인상 같이 머리를 틀어 올려 장식 띠로 묶고 두 손으로 복숭아를 들고 있는 동녀상이 놓여 있다.[1]
3. 6. 문화재적 가치
안양암 명부전 시왕상과 권속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드문 사례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안양암과 진관사에만 이러한 시왕상과 권속이 남아 있다.[1] 따라서 20세기 초 시왕상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귀중한 예로 평가되어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1]참조
[1]
간행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5호,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및문화재자료지정》
http://event.seoul.g[...]
서울특별시장
2004-10-05
[2]
간행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1호, 《서울특별시 지정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http://event.seoul.g[...]
서울특별시장
2009-06-0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