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내각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미키 내각은 1974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의 붕괴 이후, 미키 다케오가 자유민주당 총재가 되면서 성립되었다. 혼슈 시코쿠 연락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여 '하시 내각'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체포되면서 자유민주당 내 반(反)주류 파벌의 '미키 밀어내기' 운동에 직면했다. 중의원 해산 시도가 각료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내각 개조를 통해 위기를 넘겼지만, 독점금지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금맥 스캔들로 인해 총사퇴한 후, 시이나 에쓰사부로 당시 자유민주당 부총재의 중재(이른바 시이나 재정)를 통해 미키 다케오가 당 총재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했다.[3][2] 혼슈 시코쿠 연락교 건설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입각하여 '하시 내각'(橋内閣|하시 나이카쿠일본어, 다리 내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3][2]
미키 내각은 혼슈 시코쿠 연락교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하시 내각’(橋内閣|하시 나이카쿠일본어, 다리 내각)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2. 성립 배경 및 정치 상황
미키 내각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추진했으나 자민당 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1976년 록히드 사건이 불거지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체포되면서, 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어 내각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이후 '미키 밀어내기'라 불리는 당내 반발로 이어졌다.[3][2]
미키 내각 시기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3][2]2. 1.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의 붕괴
이전 내각인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제2차 개조내각은 다나카 금맥 문제로 인해 총사퇴했다. 이후, 이른바 시이나 재정을 통해 미키가 자유민주당 총재로 추대되어 미키 내각을 조각했다.
2. 2. '시이나 재정'과 미키 다케오의 총재 선출
이전 내각이었던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제2차 개조내각은 다나카 금맥 스캔들로 인해 총사퇴했다. 이후 후임 자유민주당 총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당 부총재였던 시이나 에쓰사부로의 중재, 이른바 ‘시이나 재정’을 통해 미키 다케오가 총재로 선출되었다. 이는 금권 정치 스캔들 이후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자민당 내 파벌 간의 역학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청렴한 이미지의 미키가 중재자 역할로 부상한 결과였다.[3][2] 이렇게 성립된 미키 내각은 혼슈 시코쿠 연락교 건설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입각하여 '하시 내각'(橋内閣|하시 나이카쿠일본어, 다리 내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3][2]
2. 3. '미키 밀어내기'와 내각의 위기
미키 내각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을 추진했으나, 이는 자유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샀다. 1976년 2월 록히드 사건이 터지자 미키 총리는 사건의 철저한 해명을 약속했고, 수사가 진행되어 같은 해 7월 27일에는 전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가 뇌물죄 혐의로 체포되었다.
미키 내각은 록히드 사건 수사를 통해 정계 정화를 이루려 했지만, 내각의 인기 회복과 연명을 위해 검찰을 동원하여 다나카를 체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고, 자유민주당 내 반주류 파벌들(다나카파, 오히라파, 후쿠다파, 후나다파, 미즈타파, 시이나파)은 연합하여 소위 '미키 밀어내기'(三木おろし|미키 오로시일본어)라 불리는 격렬한 반 미키 운동을 전개하며 내각 퇴진을 압박했다.
미키 총리는 이러한 당내 반발에 맞서 중의원 해산을 통해 국면을 돌파하고자 했으나, 15명의 각료가 해산 조서 서명에 반대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 각료 대량 파면까지 고려했으나 결국 해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내각 개조와 당 집행부 교체를 통해 당내 갈등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미키 내각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개혁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중의원을 통과했음에도 참의원에서 폐기되었고, 1975년 7월 29일 정부·자민당 수뇌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재제출은 보류되었다.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조기 비준, 총재 공선제 도입 등 다른 주요 정책들도 실현되지 못했다.[3][2]
3. 주요 정책 및 성과
다나카 가쿠에이 금맥 스캔들 이후 출범한 미키 내각은 정치 개혁을 추진하여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1976년 록히드 사건이 불거지고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체포되면서, 사건 처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인해 ‘미키 밀어내기’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독점금지법 개정이나 핵 확산 금지 조약 조기 비준 등 다른 개혁 과제들은 실현되지 못했다.[3]
주요 대외 활동으로는 1975년 쇼와 천황과 고준 황후의 미국 방문이 있었고, 같은 해 프랑스 랑부예에서 열린 제1회 주요국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또한, 임기 중 공공기업체 등 노동조합협의회에 의한 파업 강행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도 직면했다.
3. 1. 정치 개혁
다나카 가쿠에이 금맥 스캔들로 이전 내각이 총사퇴한 후, 미키는 소위 ‘시이나 재정’을 통해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했다. 미키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정치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이었다. 금권 정치의 폐해를 막고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으나, 이는 자유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976년 2월 록히드 사건이 터지자 미키 총리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같은 해 7월 27일에는 전직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가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키 내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계 정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당내에서는 미키 총리가 인기를 얻고 내각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해 다나카를 표적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다나카파, 오히라파, 후쿠다파 등 당내 반주류 세력은 연합하여 ‘미키 밀어내기’라고 불리는 격렬한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미키 총리는 이에 맞서 중의원 해산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묻고자 했으나, 15명의 각료가 해산 조서 서명을 거부하며 반대했다. 각료 대량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고려했으나 결국 해산을 포기하고 내각 개조와 당직 개편으로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키 내각이 실현한 개혁은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에 그쳤다. 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은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참의원에서 폐기되었고, 이후 재추진도 보류되었다. 그 외 핵 확산 금지 조약 조기 비준, 총재 공선제 도입 등 다른 개혁 과제들도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3]
3. 2. 외교 및 안보
1975년에는 쇼와 천황과 고준 황후가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전후 미일 관계 강화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같은 해 프랑스 랑부예에서 열린 제1회 주요국 정상회의(선진국 수뇌 회의)에 참가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1976년에는 소련 공군 조종사가 최신예 전투기인 미그-25기를 몰고 일본으로 망명한 벨렌코 중위 망명 사건이 발생하여, 냉전 하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의 안보 문제가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미키 내각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조기 비준을 추진하였으나,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임기 내에 실현하지는 못했다.[2]
4. 내각 구성
이전 내각인 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제2차 개조내각이 다나카 금맥 스캔들로 총사퇴한 후, 시이나 에쓰사부로의 중재(소위 ‘시이나 재정’)를 통해 미키 다케오가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했다. 혼슈 시코쿠 연락교 건설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입각하여 ‘하시 내각’(橋内閣|다리 내각일본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주요 각료로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청 장관에 후쿠다 다케오, 법무대신에 이나바 오사무, 외무대신에 미야자와 기이치, 대장대신에 오히라 마사요시, 문부대신에 비 국회의원인 나가이 미치오 등이 임명되었다.
미키 내각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등을 추진했으나, 이는 자유민주당 내 반발을 샀다. 특히 1976년 2월 록히드 사건이 터지자 미키 총리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고, 수사 결과 7월 27일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체포되었다. 미키 내각은 사건 해명을 통해 정계 정화를 도모하려 했으나, 일각에서는 인기몰이와 내각 연명을 위해 검찰을 이용해 다나카를 체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당 내 반주류(다나카파, 오히라파, 후쿠다파, 후나다파, 미즈타파, 시이나파)를 중심으로 ‘미키 밀어내기’라 불리는 격렬한 내각 타도 운동이 벌어졌다.
미키 총리는 이 도각 운동에 맞서 중의원 해산을 시도했으나, 15명의 각료가 해산 조서 서명에 반대하면서 결국 포기했다. 이후 내각 개조와 당 집행부 교체를 통해 양측의 대립은 일단 진정 국면을 맞았다.[3] 1976년 9월 15일 내각 개조가 이루어졌다.
4. 1. 국무대신 (1974.12.9. ~ 1976.9.15.)
자유민주당 (미키 파벌)경제기획청 장관
자유민주당 (후쿠다 파벌)
자유민주당 (나카소네 파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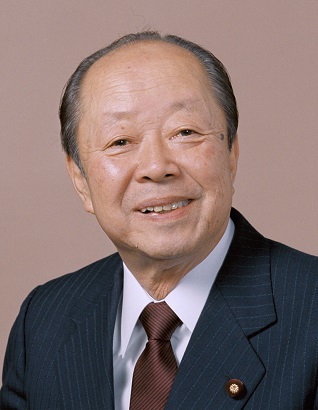
자유민주당 (오히라 파벌)
자유민주당 (오히라 파벌)
자유민주당 (후쿠다 파벌)

자유민주당 (후쿠다 파벌)

자유민주당 (미키 파벌)
자유민주당 (다나카 파벌)
자유민주당 (미즈타 파벌)
자유민주당 (무파벌)
자유민주당 (다나카 파벌)
1976년 1월 15일 재임 중 사망
자유민주당 (미키 파벌)
자유민주당 (다나카 파벌)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홋카이도 개발청 장관

자유민주당 (후나다 파벌)

자유민주당 (미키 파벌)
오키나와 개발청 장관
자유민주당 (오히라 파벌)
자유민주당 (시이나 파벌)
자유민주당 (다나카 파벌)
자유민주당 (무파벌)
자유민주당 (오히라 파벌)
자유민주당 (다나카 파벌)
자유민주당 (미키 파벌)
자유민주당 (후쿠다 파벌)
1975년 12월 26일 사임
자유민주당 (후쿠다 파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