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법사회학은 법을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법이 사회 제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막스 베버, 에밀 뒤르켐 등 초기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법실증주의와는 다르게 법을 단순히 국가가 만든 규칙 체계로 보지 않고, 사회적 규범,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법다원주의, 자동생산, 법적 문화, 페미니즘, 세계화 등 다양한 관점을 통해 법을 연구하며, 법과 사회, 사회법학, 사회법학 연구 등 여러 하위 분야를 포함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사회학 - 피해자학
피해자학은 범죄 피해자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피해자의 정의, 권리, 범죄 피해 결과 등을 다루며 피해자 구제와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 법사회학 - 법인류학
법인류학은 법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법적 다원주의, 질서와 분쟁,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법의 정의와 기능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사회 및 사회과학 - 지리학
지리학은 지구와 천체의 특징, 현상, 그리고 공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다. - 사회 및 사회과학 - 인류학
인류학은 인간의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형질인류학, 문화인류학, 고고학, 언어인류학 등의 분야로 나뉘어 인간의 진화, 문화적 다양성, 사회 조직, 언어의 기원과 발전을 탐구하며,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 법사회학 | |
|---|---|
| 지도 정보 | |
| 학문 분야 | |
| 분야 | 사회학의 하위 분야 |
| 하위 분야 | 법학 및 사회학 |
| 관련 분야 | 법철학, 사회학 이론, 사회심리학 |
| 기본 정보 | |
| 설명 | 법률과 사회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사회학의 하위 분야 |
| 주요 관심사 | 법률 제도, 법적 행위, 법적 담론, 법률 문화 |
| 목표 | 사회 현상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영향력 이해 |
| 역사 | |
| 발전 배경 | 에밀 뒤르켐 및 막스 베버 등의 사회학적 관점 |
| 주요 학자 | 외젠 에를리히, 게오르크 지멜, 테오도르 가이거, 니클라스 루만, 위르겐 하버마스 |
| 초기 연구 | 법률의 사회적 기원과 기능에 대한 탐구 |
| 현대 연구 | 법률의 사회적 영향력, 법적 변화, 사법 제도 연구 |
| 접근 방식 | |
| 사회학적 관점 | 사회 구조, 문화, 권력 관계를 통한 법률 분석 |
| 비판적 관점 | 법률의 불평등, 차별,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
| 실증적 관점 | 법률의 실제 효과 및 사회적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 해석학적 관점 | 법률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주관적 및 문화적 요인 분석 |
| 주요 연구 주제 | |
| 법률과 사회 변화 | 법률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영향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률의 역할 연구 |
| 법적 문화 | 사회 구성원들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신념, 가치 연구 |
| 법적 제도 | 법원, 경찰, 변호사 등 법적 제도 및 그 기능 연구 |
| 법률과 권력 | 법률과 정치, 경제, 사회적 권력 관계 연구 |
| 법과 불평등 | 법률의 불평등한 적용 및 결과에 대한 연구 |
| 범죄와 일탈 | 범죄와 일탈의 사회적 원인 및 법적 대응에 대한 연구 |
| 사법 제도 | 사법 제도의 운영 방식, 효율성 및 공정성 연구 |
| 법률의 효과 | 법률의 실제 사회적 결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 연구 방법 | |
| 양적 연구 | 통계적 분석 및 설문 조사를 통한 법률 연구 |
| 질적 연구 | 면접, 사례 연구, 내용 분석 등을 통한 법률 연구 |
| 법률 및 사회 자료 | 법률 문서, 판례, 사회 통계 등의 자료 분석 |
| 참여 관찰 | 법적 환경에 대한 직접 관찰을 통한 법률 연구 |
| 주요 학문적 기여 | |
| 법률의 사회적 이해 | 법률을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대한 기여 |
| 법률의 실질적 효과 | 법률의 실제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이해 확대 |
| 법률 개혁 | 법률이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연구 |
| 참고 문헌 | |
| 추가 자료 | 루만, 니클라스 . (2015). 법사회학 .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
2. 지적 기원
법사회학의 뿌리는 20세기 전환기의 사회학자들과 법학자들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간다. 막스 베버와 에밀 뒤르켐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탐구한 선구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의 저술은 오늘날 법사회학의 기초가 되었다.[11]
테오도르 가이거는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을 분석하고, 법이 민주 사회에서 사회 변혁의 요인이 되는 방식을 강조했다.[27] 그는 가치 허무주의를 통해 냉철한 민주주의 건설을 장려하는 법적 허무주의의 길을 열었다.[28]
조르주 귀르비치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법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통합과 협력의 법으로서 "사회법" 개념을 고안했는데,[29] 이는 법적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초기 사회학적 기여 중 하나이다.[30]
아르헨티나에서는 카를로스 코시오의 연구를 통해 법사회학이 초기 수용되었다. 남미 연구자들은 비교법과 사회학적 통찰, 헌법과 사회, 인권, 법적 관행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다.[31]
식민지 시대 인도의 법률 저술가들은 주로 토착 관습과 종교 전통을 편찬했으며, 토착법을 대체하는 영미법은 무시했다. 입법 권한이 확립된 후, 존 오스틴의 영향을 받은 인도 법학자들이 성문화와 영미법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아슈토시 무케르지는 "법은 거래도 아니고 엄숙한 속임수도 아니지만, 그 단어의 적절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과학이다"라고 언급했다.[32]
일본 법사회학의 시초는 스에히로 이즈타로이다. 스에히로는 오이겐 에를리히를 본받아 “살아있는 법”과 “법률”을 구분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법률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3][124] 그의 지위는 아즈마 사카에를 거쳐 가와시마 다케요시, 호시노 에이이치 등에게 계승되었다. 전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와타나베 요조 등이 연구를 시작하여 하세가와 마사야스, 이에나가 사부로 등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이후 학문으로서는 쇠퇴했다.[125]
2. 1. 막스 베버 (Max Weber)
막스 베버는 사회 내 지배의 한 유형으로서 소위 "합리적 법 형식"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규범에 귀속된다고 보았다.[12] 그는 일관되고 계산 가능한 법의 체계를 합리적-법적 권위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이러한 일관되고 계산 가능한 법은 근대 정치 발전과 근대 관료 국가의 전제 조건을 형성했으며 자본주의의 성장과 병행하여 발전했다.[13] 근대 법의 발전에 중추적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한 법의 형식적 합리화이다. 근대 합리화된 법은 또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때 성문화되고 비인격적이다. 일반적으로 베버의 관점은 법과학의 내적 관점과 법철학의 도덕적 접근과는 달리 법의 경험적 특성을 연구하는 법에 대한 외부적 접근으로 묘사될 수 있다.[14]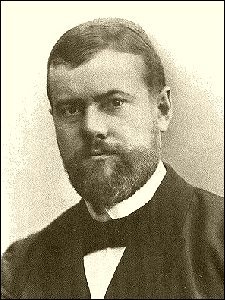
2. 2. 에밀 뒤르켐 (Émile Durkheim)
에밀 뒤르켐은 ''사회 분업론''에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주로 반환과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의 규모가 형법과 형벌보다 커진다고 주장했다.[15]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은 억압적 법에서 반환적 법으로 변화를 겪었다. 반환적 법은 개인의 변화가 크고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작용한다.[16] 뒤르켐에게 있어 법은 사회 통합 방식의 지표이며, 이는 동일한 부분들 사이의 기계적 통합 또는 산업 사회와 같이 차별화된 부분들 사이의 유기적 통합일 수 있다. 뒤르켐은 또한 법에 반영된 가치 체계의 발전을 연구하는 도덕 사회학과 함께, 그리고 밀접하게 법사회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17]
2. 3. 오이겐 에를리히 (Eugen Ehrlich)
우겐 에를리히는 ''법사회학의 기본 원리(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ology of Law)''에서 사회 네트워크와 집단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조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법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18] 그는 법과 일반적인 사회 규범 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국가의 강제적 규범으로서 공식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실정법"과 사람들이 실제로 준수하고 사회 생활을 지배하는 행동 규칙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법"을 구분했다. 살아있는 법은 사람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사회적 연합을 형성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장했다.[19]한스 켈젠과 같은 법실증주의 지지자들은 "국가가 만든 법과 비국가 사회적 연합의 조직적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구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21] 한스 켈젠에 따르면, 에를리히는 ''Sein''("is")과 ''Sollen''("ought")을 혼동했다.[22] 그러나 일부는 에를리히가 변호사가 배우고 적용하는 실정법(또는 국가법)과 에를리히가 "살아있는 법"이라고 부르는 다른 형태의 '법', 즉 일반적으로 갈등이 변호사와 법원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3]
2. 4. 레온 페트라지츠키 (Leon Petrazycki)
레온 페트라지츠키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 법"과,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정신 과정으로 구성되어 외부 권위와 무관한 법적 경험인 "직관적 법"을 구분했다.[24] 페트라지츠키의 연구는 사회학적 문제를 다루었고, 관찰을 통해서만 사물이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에 그의 방법은 경험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론을 사회학이 아닌 인지 심리학과 도덕 철학의 언어로 표현하여, 법사회학 발전에 대한 그의 기여는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다.[25] 페트라지츠키의 "직관적 법"은 조르주 귀르비치의 "사회 법" 개념(아래 참조) 발전뿐만 아니라 후대 사회법학자들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페트라지츠키의 연구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는 폴란드 법사회학자인 아담 포드고레츠키가 있다.[26]2. 5. 기타 초기 법사회학자들
막스 베버와 에밀 뒤르켐 외에도, 레온 페트라지츠키, 우겐 에를리히, 조르주 귀르비치와 같은 법학자들은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법의 사회학적 이론을 개발하려 했다.[11]레온 페트라지츠키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식 법"과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정신 과정으로 구성된 법적 경험인 "직관적 법"을 구분했다.[24] 페트라지츠키의 "직관적 법"은 조르주 귀르비치의 "사회 법" 개념과 후대 사회법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제자 중에는 폴란드 법사회학자인 아담 포드고레츠키가 있었다.[26]
테오도르 가이거는 마르크스주의 법 이론을 분석하고, 법이 민주 사회에서 사회 변혁의 요인이 되는 방식을 강조했다.[27] 그는 가치 허무주의를 통해 냉철한 민주주의 건설을 장려하는 법적 허무주의의 길을 열었다.[28]
조르주 귀르비치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법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통합과 협력의 법으로서 "사회 법" 개념을 고안했는데,[29] 이는 법적 다원주의 이론에 대한 초기 사회학적 기여 중 하나이다.[30]
아르헨티나에서는 카를로스 코시오의 연구를 통해 법사회학이 초기 수용되었다. 남미 연구자들은 비교법과 사회학적 통찰, 헌법과 사회, 인권, 법적 관행에 대한 심리사회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다.[31]
식민지 인도의 법률 저술가들은 주로 토착 관습과 종교 전통을 편찬했으며, 토착법을 대체하는 영미법은 무시했다. 입법 권한이 확립된 후, 존 오스틴의 영향을 받은 인도 법학자들이 성문화와 영미법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아슈토시 무케르지는 "법은 거래도 아니고 엄숙한 속임수도 아니지만, 그 단어의 적절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과학이다"라고 언급했다.[32]
일본 법사회학의 시초는 末弘嚴太郎이다. 末弘은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를 본받아 “살아있는 법”과 “법률”을 구분하고, 판례를 연구하여 법률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3][124] 그의 지위는 아즈마 사카에(Azuma Sakae)를 거쳐 카와시마 타케요시(Kawashima Takeyoshi), 호시노 에이이치(Hoshino Eiichi) 등에게 계승되었다. 전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와타나베 요조(Watanabe Yozo) 등이 연구를 시작하여 하세가와 마사야스(Hasegawa Masayu), 이에나가 사부로(Ienaga Saburo) 등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이후 학문으로서는 쇠퇴했다.[125]
3. 법학 연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법사회학은 법을 사회와 독립된 규칙, 교리, 판결 체계로만 보지 않고,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제도적 관행으로 본다.[82] 법의 규칙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법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법은 종교, 정치, 경제 등 다른 사회 제도와 독립적으로 기능하려 하지만, 역사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사회학은 법과 다른 제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경험적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83]
사회 진화는 법을 통해 문명화된 삶의 기준으로 전환시켰다. 규칙과 법 원칙은 추상화되고, 시스템은 자율성과 통제력을 얻어 종교적 정당성과 관습 없이 사회 규범 질서를 관리한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1) 정치, 종교 등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자율성을 가지며, 국가 권력으로 구속력을 얻고 행동 규범을 부과한다. 또한, 일상 언어와 거리를 두는 특수한 언어 형식을 가진다.
- (2) 법률가들의 전문 조합(국회의원, 판사, 사무변호사, 법률학자)을 가진다.
- (3) 전통보다 체계화의 힘으로 구상된 제도이다.
- (4) 법규 등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위한 교육 과정을 가진다.[84]
우겐 에를리히의 "살아있는 법"과 조르주 귀르비치의 "사회 법" 개념처럼, 법사회학은 공식적인 법 외에 비공식적 규범도 법으로 이해한다. 법사회학은 법 제도가 사회 계층,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내부 규범 질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한다. 즉, 법은 사회 제도, 집단,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연구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적 다원주의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85]
3. 1. 현대 법사회학
법사회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학문 분야 및 실증 연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33] 탈콧 파슨스는 법을 사회 통제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했다.[34] 기능주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법에 대한 다른 사회학적 관점들이 등장했다. 비판적 사회학자들은[35] 법을 권력의 도구로 보았다. 필립 젤츠닉 등은 현대 법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도널드 블랙은 순수 사회학에 기반한 법 이론을 발전시켰고,[37] 니클라스 루만은 자기생산 시스템 이론에서 법을 사회의 10가지 기능 시스템 중 하나로 제시했다.[39][40]유르겐 하버마스는 루만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이 '일상생활' 사람들의 이익을 더 잘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에르 부르디외 등은 법을 행위자들이 자본을 위해 투쟁하며 변호사의 전문적 습관을 개발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보았다.[42] 폴란드에서는 아담 포드고레츠키, 스웨덴에서는 페르 스테른퀴스트, 노르웨이에서는 빌헬름 오베르트가 법사회학 실증 연구를 개척했다.
최근 법사회학에는 미셸 푸코, 유르겐 하버마스,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신마르크스주의, 행동주의 등 다양한 이론이 등장했다. 이러한 이론적 영향은 법과 사회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다학문적 법과 사회 분야는 여전히 인기 있지만, 법사회학은 제도적, 전문적으로 더 잘 조직되었다.[43]
3. 2. 법과 사회 (Law and Society)
탈콧 파슨스는 그의 연구에서 법을 사회 통제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했다.[34] 기능주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법에 대한 다른 사회학적 관점들이 등장했다. 비판적 사회학자들은[35] 법을 권력의 도구로 보았다. 그러나 필립 젤츠닉과 같은 법사회학 이론가들은 현대 법이 사회의 요구에 점점 더 부응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미국의 사회학자 도널드 블랙은 순수 사회학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법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 "순수 과학"으로서의 법사회학은 범죄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법, 도덕, 교육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사회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의 산물로 접근하는 무질서, 폭력 및 범죄의 ''기능'' 또는 결과에 집중한다.[37] 반대로, "응용 과학"으로서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 특히 범죄 관련 문제에서 원인과 결과 연구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단점을 고려할 때 – 현대 사회학자들의 관심은 ''위험 요소''(예: 어린이와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와 ''보호 요소''( "정상적인" 성격과 "좋은" 지역 사회 구성원을 낳는 경향이 있는 것)의 식별 및 분석에 흡수된다.[38]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의 자기생산 시스템 이론은 법 또는 "법 체계"를 사회의 10가지 ''기능 시스템'' 중 하나로 제시한다(기능적 분화 참조).[39][40] 사회철학자 유르겐 하버마스는 루만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이 '일상생활'의 사람들의 이익을 더 충실하게 대표함으로써 '시스템' 기관으로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에르 부르디외와 그의 추종자들은 법을 행위자들이 문화적, 상징적, 경제적 자본을 위해 투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호사의 재생산적인 전문적 ''습관''을 개발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보았다.[42]
여러 유럽 대륙 국가에서 법사회학에 대한 실증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강력하게 발전했다. 폴란드에서는 아담 포드고레츠키와 그의 동료들(종종 페트라지츠키의 아이디어의 영향을 받음)의 연구가 특히 주목할 만했고, 스웨덴에서는 이 시기 법사회학에 대한 실증 연구는 특히 페르 스테른퀴스트에 의해, 노르웨이에서는 빌헬름 오베르트에 의해 개척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회학 전반의 이론 확산의 결과로 법사회학에서 매우 광범위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최근의 영향 중에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 독일 사회이론가 유르겐 하버마스,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및 탈구조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및 행동주의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법사회학에서 다양한 이론적 영향은 더 광범위한 법과 사회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학문적인 법과 사회 분야는 여전히 매우 인기가 있는 반면, 법사회학의 학문적 전문 분야는 "제도적 및 전문적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잘 조직되어 있다".[43]
법과 사회(Law and Society)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법 연구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들의 주도로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다.[44] 법과 사회 운동의 기본 원리는 로렌스 프리드먼의 "미국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요약된다.[45] 창립자들은 "법과 법적 제도를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것이 학제 간 대화와 다학제적 연구 방법에 대한 헌신을 특징으로 하는 학문 분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46] "이 연구의 기본적인 가정은 법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학 연구는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법 체계 내부를 들여다보지만", "법과 사회 운동은 외부를 살펴보고, 있다면 자율성의 정도를 경험적인 질문으로 다룬다."[47] 법과 사회 연구는 법이 발효된 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데, 이는 기존 법학 연구에서는 무시되거나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다.[48] 1964년 법과 사회 협회(Law and Society Association)와 1966년 ''법과 사회 리뷰''(Law and Society Review)의 설립은 법과 사회 운동의 학문적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했고, 회원들이 미국의 법 교육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49]
법 사회학과 법과 사회 운동의 주된 차이점은 후자가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사회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과학 분야의 통찰력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50] "법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 사회인류학자, 정치학자뿐만 아니라 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와 경제학자도 받아들인다."[51] 법 사회학과 법과 사회 운동 모두 다학제적 또는 융합적 사업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법 사회학은 사회학의 방법, 이론 및 전통과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52]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법과 사회 학자들은 갈등과 분쟁 해결에 관한 많은 독창적인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윌리엄 펠스타이너는 초기 연구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방법(회피, 중재, 소송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처드 에이벨과 오스틴 사랫과 함께 펠스타이너는 분쟁 피라미드와 "명명, 비난, 청구" 공식을 개발했는데, 이는 갈등 해결의 여러 단계와 피라미드의 수준을 나타낸다.[53]
기존의 법에 대한 이해(법)와는 대조적으로, 법 사회학은 일반적으로 법을 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규칙, 교리 및 판결의 체계로만 보고 정의하지 않는다. 법의 규칙 기반 측면은 분명 중요하지만, 사회적 맥락에서 법을 묘사하고 분석하며 이해하기 위한 불충분한 기반을 제공한다.[82] 따라서 법 사회학은 법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문화적, 경제적, 사회정치적 구조 및 제도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발전한 일련의 제도적 관행으로 간주한다. 현대 사회 시스템으로서 법은 종교, 정치, 경제와 같은 다른 사회 제도 및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자율성을 얻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기능적으로 이러한 다른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법 사회학의 목표 중 하나는 현대 법의 다른 사회 제도와의 상호 의존성을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방법론을 고안하는 것이다.[83]
사회적 진화는 법을 “혈연”이나 영토의 정체성에 의해 조건화된 전통적인 유대를 대체하여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위자들 사이의 특히 법적이고 자발적인 새로운 유형의 종속을 통해 문명화된 삶의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전환시켰다. 규칙과 법적 원칙의 추상화 정도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시스템은 자체 역학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얻어 사회의 규범 질서가 종교적 정당성과 관습의 권위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정치, 종교, 비법적 제도 및 기타 학문 분야와 관련하여 자율성; 국가의 힘 덕분에 구속력을 얻고 효과를 유지하며 개인, 사회 집단 및 전체 사회에 행동 규범을 부과하는 일련의 고정된 규칙; 그리고 사회 기술, 매우 특별하고 인위적인 언어 형태를 갖춘 행동 규제 시스템으로 모호하고 유동적인 일상 언어와는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2) 입법자, 판사, 변호사, 법학자들의 기업 및 전문 조합;
(3) 전통보다는 체계화의 힘으로 구상된 이상화된 제도; 그리고
(4) 사법적 실체, 규칙, 규정, 법령 등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위한 교육 과정.[84]
법 사회학 내의 몇몇 영향력 있는 접근 방식은 공식적인 (국가) 법의 관점에서 법의 정의에 도전했다(외겐 에를리히의 "살아있는 법" 개념과 조르주 귀르비치의 "사회 법"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법은 법 체계와 공식적(또는 공식적) 법적 제도 및 과정뿐만 아니라 집단, 협회 및 공동체 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비공식적(또는 비공식적) 규범성과 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된다. 따라서 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법 체계의 규칙이나 제도가 사회 계급,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및 기타 사회 범주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분석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변호사, 사업가, 과학자, 정당원 또는 마피아 구성원과 같은 다양한 집단과 "공동체"의 내부 규범 질서가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도 초점을 맞춘다. 간단히 말해, 법은 사회 제도, 집단 및 공동체의 필수적이고 구성적인 부분으로 연구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법적 다원주의에 대한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85]
3. 3. 사회법학 (Sociological Jurisprudence)
막스 베버는 사회 내 지배의 한 유형으로서 "합리적 법 형식"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규범에 귀속된다고 보았다.[12] 그는 일관되고 계산 가능한 법 체계를 합리적-법적 권위의 관점에서 이해했다. 이러한 법은 근대 정치 발전과 근대 관료 국가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자본주의의 성장과 병행하여 발전했다.[13] 근대 법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한 법의 형식적 합리화였다. 근대 합리화된 법은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될 때 성문화되고 비인격적이다. 베버의 관점은 법과학의 내적 관점이나 법철학의 도덕적 접근과는 달리, 법의 경험적 특성을 연구하는 법에 대한 외부적 접근으로 묘사될 수 있다.[14]3. 4. 사회법학 연구 (Socio-Legal Studies)
법사회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학문 분야 및 실증 연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33] 탈콧 파슨스는 법을 사회 통제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했지만,[34] 비판적 사회학자들은 법을 권력의 도구로 보는 관점을 발전시켰다.[35] 필립 젤츠닉은 현대 법이 사회의 요구에 점점 더 부응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도널드 블랙은 순수 사회학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법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37] 니클라스 루만은 자기생산 시스템 이론에서 법 또는 "법 체계"를 사회의 10가지 기능 시스템 중 하나로 제시한다.[39][40]유르겐 하버마스는 법이 '일상생활'의 사람들의 이익을 더 충실하게 대표함으로써 '시스템' 기관으로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법을 행위자들이 문화적, 상징적, 경제적 자본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본다.[42] 최근에는 미셸 푸코, 유르겐 하버마스,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및 탈구조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및 행동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이 법사회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과 사회 분야는 다학문적인 반면, 법사회학은 "제도적 및 전문적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잘 조직되어 있다".[43]
법과 사회(Law and Society)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법 연구에 관심 있는 사회학자들의 주도로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이다.[44] 로렌스 프리드먼은 "미국에서 법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라고 하였다.[45] 창립자들은 법과 법적 제도를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하는 학제 간 대화와 다학제적 연구 방법에 대한 헌신을 특징으로 하는 학문 분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46] "법과 사회 운동은 외부를 살펴보고, 있다면 자율성의 정도를 경험적인 질문으로 다룬다."[47] 1964년 법과 사회 협회(Law and Society Association)와 1966년 ''법과 사회 리뷰''(Law and Society Review)의 설립은 법과 사회 운동의 학문적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했다.[49]
법 사회학과 법과 사회 운동의 주된 차이점은 후자가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사회학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회과학 분야의 통찰력을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50] 법 사회학은 사회학의 방법, 이론 및 전통과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52]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법과 사회 학자들은 갈등과 분쟁 해결에 관한 많은 독창적인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 윌리엄 펠스타이너는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적인 방법(회피, 중재, 소송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처드 에이벨과 오스틴 사랫과 함께 펠스타이너는 분쟁 피라미드와 "명명, 비난, 청구" 공식을 개발했다.[53]
법사회학은 일반적으로 사회법학과 구분된다. 사회법학은 법학의 한 형태로서 법률적 논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법학은 법적 제도와 관행의 변화, 그리고 법적 사상의 사회적 원천과 영향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54]
사회법학은 미국에서 루이스 브란다이스와 로스코 파운드에 의해 발전되었다.[55][56][57] 외겐 에를리히와 조르주 귀르비치와 같은 선구적인 법사회학자들의 연구에서 영향을 받았다.[58]
법의 사회과학적 연구의 여러 분야를 구분하면 주류 사회학과 법학 연구와 관련하여 법사회학의 발전을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잠재적으로 인위적인 구분이 전체 분야의 발전에 반드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59]
영국의 사회법학(Socio-legal studies)은 주로 법과 관련된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하려는 법과대학의 관심에서 성장해왔다.[60] 사회법학은 법과의 관계 및 법 내에서의 반대적 역할을 고려하여 종종 논의된다.[61] 따라서, 사회과학과 훨씬 더 강력한 학문적 유대 관계를 갖는 많은 서유럽 국가들의 법사회학이나 미국의 법과 사회 연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사회법학이 법사회학의 응용 분야로 제시되었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이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62] 맥스 트래버스는 사회법학을 사회 정책의 하위 분야로 간주하며, "주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63]고 언급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일반 이론을 개발하려던 과거의 열망을 포기했다"고 덧붙인다.[64]
사회법학의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는 캐롤 스마트 교수, 관계 및 개인 생활 연구 모건 센터의 공동 소장, 그리고 옥스퍼드 가족법 및 정책 센터(OXFLAP)의 공동 소장인 메이비스 맥린 교수와 존 이클라가 있다.
'''사회법학 연구 방법'''
법사회학에는 사회법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조사 방법은 없다. 대신, 법 및 법적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 연구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사회법 분야에서는 실증주의적[65]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해석적(담화 분석 등) 및 인류학적[66] 접근 방식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사용한다.[67]
3. 5. 영국의 법사회학
영국의 사회법학(Socio-legal studies)은 주로 법과 관련된 학제 간 연구를 장려하려는 법과대학의 관심에서 성장해왔다.[60] 이것이 신흥 학문인지, 하위 학문인지, 아니면 방법론적 접근 방식인지는 법과의 관계 및 법 내에서의 반대적 역할을 고려하여 종종 논의된다.[61] 따라서, 사회과학과 훨씬 더 강력한 학문적 유대 관계를 갖는 많은 서유럽 국가들의 법사회학(legal sociology)이나 미국의 법과 사회(Law and Society) 연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과거에는 사회법학이 법사회학의 응용 분야로 제시되었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이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62] 예를 들어, 맥스 트래버스(Max Travers)는 사회법학을 사회 정책의 하위 분야로 간주하며, "주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 정책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63]고 언급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일반 이론을 개발하려던 과거의 열망을 포기했다"고 덧붙인다.[64]
사회법학의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는 캐롤 스마트 교수, 관계 및 개인 생활 연구 모건 센터(Morgan Centre for the Study of Relationships and Personal Life)(사회학자 데이비드 모건의 이름을 딴 아서 루이스 빌딩에 위치)의 공동 소장, 그리고 옥스퍼드 가족법 및 정책 센터(OXFLAP)의 공동 소장인 메이비스 맥린 교수와 존 이클라가 있다.
사회법학 연구 방법법사회학에는 사회법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개발된 조사 방법이 없다. 대신, 법 및 법적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 연구 기법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사회법 분야에서는 실증주의적[65]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해석적(담화 분석 등) 및 인류학적[66] 접근 방식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사용한다.[67]
4. 법의 사회학적 개념 고안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달리, 법사회학은 법을 단순히 사회와 독립된 규칙, 교리, 결정 체계로 보지 않는다. 법사회학은 법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관행의 집합으로 간주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 경제, 사회정치적 구조 및 제도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한다.[142] 현대 사회에서 법은 종교, 정치, 경제 등 다른 사회 제도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율성을 획득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기능적으로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법사회학의 목표 중 하나는 현대 법과 다른 사회 제도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142]
사회 진화는 법을 문명화된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위자 간의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새로운 유형의 종속을 통해, "혈통"이나 영토 정체성에 기반한 전통적 유대를 대체했다. 규칙과 법적 원칙은 추상화되고, 시스템은 자율성과 통제력을 얻어 종교적 합법성과 관습의 권위 없이 사회의 규범 질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143]
# 정치, 종교, 비법률 기관 및 기타 학문 분야와 관련된 자율성을 가진다. 이는 국가 권력 덕분에 구속력을 얻고, 개인, 사회 집단, 사회 전체에 행동 규범을 부과하는 일련의 고정된 규칙이다. 또한, 사회적 기술이자, 매우 특별하고 인위적인 언어 형식을 부여받은 행동 규제 시스템으로, 모호하고 유동적인 구어와 거리를 둔다.
# 국회의원, 판사, 사무변호사, 법률학자로 구성된 전문 조합을 가진다.
# 전통보다는 체계화의 힘으로 생각되는 이상화된 제도이다.
# 법인체, 규칙, 규정, 법령 등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지향하는 교육 과정을 가진다.
법사회학 내 일부 접근 방식은 공식적인 법 측면에서 법의 정의에 도전한다. (예: 우겐 에를리히의 "살아있는 법", 조르주 귀르비치의 "사회법"). 이들은 법을 법률 시스템과 공식적인 법률 제도 및 과정뿐만 아니라, 집단, 협회, 공동체 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비공식적인 규범과 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법률 시스템의 규칙이나 제도가 사회 계층,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공동체"의 내부 규범 질서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즉, 법은 사회 기관, 집단, 공동체의 통합적이고 구성적인 부분으로 연구된다.
5. 현대적 관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사회학은 학문 분야 및 실증 연구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33] 탈콧 파슨스는 법을 사회 통제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간주했다.[34] 기능주의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법에 대한 다른 사회학적 관점들이 등장했는데, 비판적 사회학자들은[35] 법을 권력의 도구로 보았다.
필립 젤츠닉은 현대 법이 사회의 요구에 점점 더 부응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6] 도널드 블랙은 순수 사회학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법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발전시켰다.[37] "응용 과학"으로서 법사회학은 범죄 관련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현대 사회학자들은 '위험 요소'와 '보호 요소' 식별 및 분석에 관심을 가진다.[38]
니클라스 루만은 자기생산 시스템 이론에서 법을 사회의 10가지 기능 시스템 중 하나로 제시한다.[39][40] 유르겐 하버마스는 법이 '일상생활' 사람들의 이익을 더 충실하게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루만과 다른 견해를 보였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법을 행위자들이 자본을 위해 투쟁하고 변호사의 전문적 습관을 개발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보았다.[42]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유럽 대륙 국가에서 법사회학에 대한 실증 연구가 활발하게 발전했다. 폴란드에서는 아담 포드고레츠키와 그의 동료들, 스웨덴에서는 페르 스테른퀴스트, 노르웨이에서는 빌헬름 오베르트가 법사회학 연구를 개척했다.
최근 법사회학에는 미셸 푸코, 유르겐 하버마스,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탈구조주의, 신마르크스주의, 행동주의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영향은 법과 사회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사회학은 제도적, 전문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43]
법과 사회(Law and Society) 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로렌스 프리드먼은 "법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45] 법과 사회 운동은 법과 법 제도를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법의 자율성을 경험적인 질문으로 다루며, 법의 사회적 영향에 관심을 가진다.[46][47][48] 법과 사회 협회와 ''법과 사회 리뷰'' 설립은 이 운동의 학문적 활동을 지속시키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49]
법 사회학은 사회학과의 유대감을 가지는 반면, 법과 사회 운동은 모든 사회과학 분야의 통찰력을 수용한다.[50][52]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법과 사회 학자들은 윌리엄 펠스타이너, 리처드 에이벨, 오스틴 사랫 등을 중심으로 갈등과 분쟁 해결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53]
법사회학은 사회법학과 구분된다. 사회법학은 법률적 논쟁에 직접 참여하고 법적 제도와 사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 이론과 사회과학 연구에 의존한다.[54] 사회법학은 루이스 브란다이스와 로스코 파운드에 의해 발전되었고,[55][56][57] 우겐 에를리히와 조르주 귀르비치의 영향을 받았다.[58] 법의 사회과학적 연구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론적, 경험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인위적인 구분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59]
영국의 사회법학은 법과대학의 학제 간 연구 장려에서 성장했으며,[60] 법과의 관계와 법 내에서의 반대적 역할을 고려하여 논의된다.[61] 사회법학은 법사회학의 응용 분야로 제시되기도 했으며, 경험주의적이고 비이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62] 맥스 트래버스는 사회법학을 사회 정책의 하위 분야로 간주한다.[63][64] 캐롤 스마트, 데이비드 모건, 메이비스 맥린, 존 이클라 등이 사회법학의 주목할 만한 연구자이다.
법사회학 연구에는 특별한 조사 방법이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실증주의적 접근, 해석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사용된다.[65][66][67]
법 사회학은 법을 사회와 독립적인 규칙 체계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 작용하며 발전하는 제도적 관행으로 간주한다. 현대 법은 다른 사회 제도와 독립적으로 기능하려 하지만, 역사적,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법 사회학의 목표는 현대 법과 다른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성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경험적 방법론을 고안하는 것이다.[83]
사회적 진화는 법을 통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위자들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종속을 만들고, 규칙과 법적 원칙의 추상화를 증가시키며, 사회의 규범 질서가 종교적 정당성과 관습의 권위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현대 사회에서 법은 (1) 자율성, (2) 기업 및 전문 조합, (3) 체계화의 힘, (4) 교육 과정을 통해 구별된다.[84]
법 사회학은 공식적인 법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범과 규제를 포함하여 법을 폭넓게 이해한다. 법 체계와 사회 범주의 상호 작용, 다양한 집단과 공동체의 내부 규범 질서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며, 법을 사회 제도, 집단 및 공동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내용은 법적 다원주의 섹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85]
비서구 세계는 서구 문화권 밖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화권(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 중동,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을 의미한다. 법 사회학은 서구 국가에서 더 널리 퍼져 있으며, 인도 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연구는 제한적이다. 법 사회학의 세계적 확산은 불균등하며,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춘 산업화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5. 1. 법다원주의 (Legal Pluralism)
법다원주의[145]는 법사회학자와 사회인류학자들이 "단일 국가나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정당성 근거를 가진 다층적인 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개념이다. "두 개 이상의 법체계가 동일한 사회적 영역 내에서 공존하는 상황"으로 정의되기도 한다.[146] 법 다원주의자들은 법을 국가의 강제력에 뒷받침되는 법원과 판사의 체계뿐만 아니라 "비법적 규범 질서"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한다.[91] 법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법론적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며, 개념적으로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법 질서의 인식부터 국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더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법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종종 논쟁적인 법에 대한 관점"을 포괄한다. 후자의 법 개념은 두 개 이상의 법 체계가 동일한 사회적 영역에 존재할 때마다 생겨날 수 있다.[92]법다원주의는 법사회학의 시작부터 사회법 이론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외겐 에를리히(Eugen Ehrlich)와 조르주 귀르비치(Georges Gurvitch)의 사회학적 이론은 법적 다원주의에 대한 초기 사회학적 기여였다. 또한, 법 사회학과 법 인류학 내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오래 지속되는 사회법 논쟁의 주제를 제공해왔으며,[94] 여러 법 실증주의 학파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95] 비평가들은 종종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법은 다른 규범 체계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떤 사회적 규칙 체계가 법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96]
이러한 논쟁은 주로 "유일한 진정한 법은 현대 국가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법이라는 주장"에서 발생한다.[97] 이러한 관점은 "법 중심주의"로도 알려져 있다. 존 그리피스는 법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법은 그리고 법이어야 한다. 국가의 법이며,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며, 다른 모든 법을 배제하며, 단일 국가 기관 세트에 의해 관리된다."라고 썼다.[98] 따라서 법 중심주의에 따르면 "관습법과 종교법[147]은 국가가 그러한 규범 질서를 자체 법의 일부로 채택하고 다루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라고 적절하게 불리지 않는다."[148]
법적 다원주의는 "약한" 버전과 "강한" 버전으로 구분되곤 한다. "약한" 버전은 "법 중심주의"의 주요 가정에 반드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 국가법의 영역 내에서 관습법이나 이슬람법과 같은 다른 법 체계가 자율적인 (공동) 존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다.[100] 따라서 "약한" 버전은 다른 형태의 규범 질서를 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법적 다원주의 비평가 중 한 명인 타마나하(Tamanaha)는 "규범 질서란, 글쎄, 규범 질서이다. 법은 다른 것이다. 우리가 분리하여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101] 반면에 "강한" 버전은 모든 법 중심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법 모델을 "신화, 이상, 주장, 환상"으로 거부하며,[102] 국가법을 많은 법의 형태 또는 사회 질서의 형태 중 하나로 간주한다. 현대법은 다원적이며,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공무원) 법 체계가 종종 1차적 규제의 장소가 아니라 2차적 규제의 장소"라는 것이다.[103]
법적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은 종종 법 실증주의[149]의 기본 가정을 사용하여 바로 그러한 (실증주의적) 가정을 비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적 다원주의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104] 로저 코터렐(Roger Cotterrell)이 설명했듯이, 다원주의적 개념은 "법 사회학자가 법에 대한 관점을 넓히려는 노력"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법 사회학자가 법을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 변호사가 전제하는 것과 다를 수 있지만, (법적 경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에 대한 관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후자와 관련이 있다(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한다). 따라서 법 이론에서 다원주의적 접근 방식은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식하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법을 더 큰 속의 한 종으로 볼 수 있거나 변호사의 법에 대한 개념[150]을 특정 목표에 의해 결정된 특정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105]
5. 2. 자동생성 (Autopoiesis)
훔베르토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는 살아있는 세포의 자기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 생물학에서 자기 생성(Autopoiesis)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 개념은 나중에 사회학 용어로 재구성되었고, 니클라스 루만이 법사회학에 도입했다. 루만은 탈코트 파슨스의 전통적인 시스템 이론, 사이버네틱스 피드백 루프, 1960년대 자기 조직화의 구조적 이해에 기반한 설명을 비판하며, 인간화된 '주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89]루만은 사회 시스템이 인간 행위자나 규범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커뮤니케이션은 발화, 정보, 이해의 통일체이며, 반복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의사소통의 재생산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 시스템이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89]
로저 코터렐은 루만의 이론이 사회 시스템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학적 분석의 기초가 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법의 자율성에 대한 루만의 이론적 주장은 매우 강력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 코터렐은 비교주의자와 대부분의 법사회학자들이 선호하는 경험적 연구를 강조하며, 자기생성 이론의 가정은 경험적 연구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89]
5. 3. 법적 문화 (Legal Cultures)
로렌스 M. 프리드먼은 법사회학에 법문화 개념을 도입한 사회법학자 중 한 명이다. 프리드먼에게 법문화는 "법률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지식, 태도, 행동 패턴"을 가리킨다.[152] 이는 또한 "문화 전체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관습 기관"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프리드먼은 법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추상 수준, 예를 들어 법 문화 수준에서 법 문화를 탐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내부'와 '외부' 법률 문화를 구분했는데, 전자는 사법부[152]와 같은 법률 시스템 기능 담당자들의 법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리키는 반면, 후자는 시민들의 법률 시스템이나 법과 질서 전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법 문화는 "법과 관련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행동 및 태도의 패턴"을 의미하며, 문화 개념의 하위 범주로 간주된다.[112] 데이비드 넬켄에 따르면, 이는 비교법이나 초기 정치학에서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진 "법 전통(legal tradition)이나 법적 스타일(legal style)과 같은 용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법전상의 법(law in the books)'과 '실제 법(law in action)'의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체계적인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탐구한다.[113]
법 문화는 법, 법적 행동 및 법적 제도의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문화 인류학, 법적 다원주의, 비교법과 관련이 있다.
5. 4. 페미니즘 (Feminism)
법은 항상 페미니즘이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Ruth Fletcher가 지적했듯이, 페미니즘과 법의 관계는 수년간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이론과 실천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여준다.[153] 여성 단체는 전문적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적인 개념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적 논의의 조건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153]5. 5. 세계화 (Globalization)
세계화는 종종 세계 사회 수준에서 급진적인 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경제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법은 세계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1990년대에 이미 이브 드잘레이(Yves Dezalay)와 브라이언트 가스(Bryant Garth)[117], 그리고 볼크마 게스너(Volkmar Gessner)[118]에 의해 법과 세계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세계화 과정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법의 중요성은 세계화 사회학에서 종종 간과되고 있으며, 법사회학 내에서도 다소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119]할리데이(Halliday)와 오신스키(Osinsky)가 지적했듯이, "경제 세계화는 세계적인 사업 규제[155]와 그것이 점점 더 의존하는 시장의 법적 구성과는 별개로 이해될 수 없다. 문화 세계화는 법으로 제도화된 지적 재산권과 세계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주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취약한 인구 집단에 대한 보호의 세계화는 국제형사법 및 인도주의법 또는 국제 재판소의 영향을 추적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민주주의[156] 제도와 국가 건설에 대한 세계적인 논쟁은 헌법주의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120]
세계화와 세계 사회 연구에 대한 사회법적 접근 방식은 종종 법문화 및 법적 다원주의 연구와 겹치거나 이를 활용한다.[121]
6. 비서구 법사회학
동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인도 아대륙, 중동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서구 문화의 그리스-유대-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난 문화를 발전시킨 지역으로 비서구 세계에 포함된다.[144]
법사회학에 대한 관심은 서구 국가에서 더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인도 학자들이 일부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중부 및 북부 지역의 연구자가 수행한 사회법적 연구는 제한적이다. 법에 대한 사회학 연구의 세계적 확산은 민주적 정치 체제를 갖춘 산업화된 국가에 고르지 않고 집중되어 있다. 법사회학의 세계적 확장은 국가의 부/빈곤, 정치 조직의 형태, 복지국가의 성장과 같은 역사적 요인의 조합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불균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 법사회학의 시초는 末弘嚴太郎(Suehiro Gentaro)이다. 末弘은 미국 유학 시절 연구한 사회학 성과를 법해석학에 도입하여, 오이겐 에를리히(Eugen Ehrlich)를 본받아 “살아있는 법”과 “법률”을 구분하고, “살아있는 법”인 판례를 연구하여 “법률”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3][124] 그의 주장은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의 분쟁을 분석하여 현행법 운영 개선에 응용하는 것으로, 법사회학의 법해석론에 있어 일종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지위는 아즈마 사카에(Azuma Sakae)를 거쳐 카와시마 타케요시(Kawashima Takeyoshi), 호시노 에이이치(Hoshino Eiichi) 등에게 계승되어 현재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후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와타나베 요조(Watanabe Yozo) 등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여 번성하였고, 하세가와 마사야스(Hasegawa Masayasu), 이에나가 사부로(Ienaga Saburo) 등에게 영향을 주어, 쿠니스 3로(Kurusu Saburo)와 제1차 법해석 논쟁을 일으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 학문으로서는 쇠퇴했다.[125]
7. 연구자 및 연구 분야
독일의 에를리히나 막스 베버, 프랑스의 뒤르켐, 칸토로뷔츠·크로퍼드·귀르뷔치·티마세프·파운드 등이 대표적인 법사회학 연구자이다. 그 밖에도 옐리네크의 국가사회학, 페리·롬브로조 등에 의한 형사사회학·형사인류학, 메인·바호펜 등에 의한 법의 원시 형태의 연구, 분트 등에 의한 법의 민족학적 고찰 등도 특수한 형태의 법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법사회학의 시초는 스에히로 이즈타로이다. 스에히로는 미국 유학 시절 연구한 사회학의 성과를 법해석학에 도입하여, 에를리히를 본받아 실생활에 내재하는 “살아있는 법”과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다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다른 학자들에 앞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법사회학의 기초를 쌓았다.[123] 스에히로는 “살아있는 법”인 판례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법률”의 해석에 반영하는 것을 주장했다.[124] 이 주장은 사회에 존재하는 현실의 분쟁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과를 현행법 운영의 개선에 응용하는 것이며, 법사회학의 법해석론에 있어서의 일종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지위는 아즈마 사카에를 거쳐 그의 제자인 카와시마 타케요시, 호시노 에이이치 등에게 계승되어 현재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흐름과는 별도로 전후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와타나베 요조 등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하여 번성하였고, 하세가와 마사야스, 이에나가 사부로 등에게 영향을 주어, 쿠리스 사부로와 제1차 법해석 논쟁을 일으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후 학문으로서는 쇠퇴했다.[125]
8. 전문 협회 또는 학회
- 법사회학 연구위원회[122]
- 국제법사회학연구소
- 법과 사회 협회
-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법과 사회 협회(The Law and Society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Inc.) http://www.lsaanz.org/index.html
- 캐나다 법과 사회 협회/캐나다 법과 사회 협회(Canadi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 Association canadienne droit et société (CLSA/ACDS)) http://www.acds-clsa.org/
- 프랑스 사회학 협회의 법사회학 주제 네트워크 RT 13(RT 13 (Thematic Network) sociology of law of the French Sociological Association) http://www.afs-socio.fr/rt13.html
- 아르헨티나 법사회학회(Sociedad argentina de sociología jurídica|소시에다드 아르헨티나 데 소시올로히아 후리디카es) http://sasju.dyndns.org/
- 법과 사회 연구 협회 (이탈리아)(Associazione di studi su diritto e società (Italy)) http://www.dirittoesocieta.it
- 일본 법사회학회 http://wwwsoc.nii.ac.jp/hosha/english/eindex.htm
- 브라질 법사회학회(Brazilian Sociology of Law Association (ABraSD)) http://www.abrasd.com.br/
9. 학술지
- The Nordic Journal of Law and Justice영어 [http://www.retfaerd.org/]
-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de [http://www.luciusverlag.com/zeitschriften/ztschr_rechtssoziologie/zeitschrift_fuer_rechtssoziologie.htm]
- Law & Social Inquiry영어 [http://www.wiley.com/bw/journal.asp?ref=0897-6546]
- 법과 사회 리뷰 (Law and Society Review영어)
- The Journal of Law and Society영어 [http://www.wiley.com/bw/journal.asp?ref=0263-323x]
- 실증 법학 연구 저널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영어)
- Canad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영어 / Revue Canadienne Droit et Société프랑스어 (1985년 창간) [http://www.utpjournals.com/cjls/cjls.html]
- Canadian Journal of Women and the Law영어 (1985년 창간) [http://www.utpjournals.com/cjwl/cjwl.html]
- Droit et Société프랑스어 (프랑스 파리, 1985년 창간) [http://www.reds.msh-paris.fr/publications/revue/revue-en-ligne.htm]
-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w영어 (1978년 창간)
- Oñati Socio-legal Series영어 (스페인 오냐티, 2011년 창간) [http://opo.iisj.net/index.php/osls/index]
- Revista Brasileira de Sociologia do Direitopt (브라질, 2014년 창간) [http://revista.abrasd.com.br/index.php/rbsd/index]
- Revue interdisciplinaire d'études juridiques프랑스어 (벨기에 브뤼셀, 1978년 창간)
- Social & Legal Studies영어 (영국 런던, 1992년 창간) [http://sls.sagepub.com/]
- Sociologia del Dirittoit (이탈리아 밀라노, 1974년 창간) [http://www.francoangeli.it/riviste/sommario.asp?IDRivista=51]
- Zeitschrift für Rechtssoziologiede (독일 법과 사회 저널) [http://www.degruyter.com/view/j/zfrs]
10. 연구 센터
- 미국변호사재단(American Bar Foundation)
- 버펄로대학교 볼디 법률 및 사회정책 센터
- 브라질 법사회학회
- 룬드대학교 법사회학 연구소
- 제네바대학교 입법연구·기술·평가센터
- 에든버러대학교 법학대학 법과 사회 센터
- 케이프타운대학교 사회법 연구센터
- 네이털대학교 사회법 연구센터
- 옥스퍼드대학교 사회법 연구센터
-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과 사회 연구센터
- 유럽 법률 및 입법 아카데미
- 옥스퍼드대학교 울프슨 칼리지 법, 정의 및 사회 재단
- 런던대학교 컬리지 법학부 국제법 연구소
-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과 사회과학 연구소
- 위스콘신대학교 법학연구소
- 오냐티 국제법사회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Sociology of Law, Oñati)
- 뉴캐슬대학교 사법정책연구센터
- 파리2대학교 사회법 연구소
- 울롱공대학교 법률 교차점 연구센터
- 포르투갈 사법 상설 관측소
- 옥스퍼드대학교 가족법 및 정책센터
- 킬대학교 법, 정치 및 사법 연구소
참조
[1]
서적
various definitions of the sociology of law
1912-1986
[2]
서적
2008
[3]
서적
2003, 2009, 2013
[4]
서적
2007
[5]
서적
2010
[6]
서적
2005
[7]
논문
What Is "Sociology of Law"?
https://www.journals[...]
1937-09-01
[8]
서적
1976-2009
[9]
서적
2010
[10]
서적
Economic Analysis of Law
Little Brown
1973
[11]
서적
2007
[12]
서적
Max Weber on Law and Economy in Society
[13]
서적
Collins Dictionary of Sociology
[14]
서적
1983
[15]
서적
The Blackwell Dictionary of Sociology
[16]
서적
1999
[17]
서적
Durkheim's sociology of law
1999
[18]
서적
1936
[19]
서적
1979
[20]
서적
1936
[21]
서적
2008
[22]
서적
2006, 2008
[23]
서적
La Sociologie du Droit en Allemagne, Rechtstheoritische Probleme der Sociologie des Rechts
[24]
서적
1955
[25]
서적
2006, 1980, 2009
[26]
서적
1991
[27]
서적
2007
[28]
서적
2007
[29]
서적
L'idée du droit social
1932
[30]
서적
2000
[31]
서적
2004
[32]
서적
Idea and Methods of Legal Research
OUP India
[33]
서적
2009
[34]
서적
2008
[35]
서적
1992
[36]
서적
1969
[37]
서적
2019
[38]
서적
2004
[39]
서적
2004, 1995
[40]
간행물
Ten systems. Toward a canon of function systems.
https://ssrn.com/abs[...]
2015
[41]
서적
1985
[42]
서적
1996
[43]
서적
2007
[44]
서적
1986
[45]
서적
1986
[46]
서적
1998
[47]
서적
2019
[48]
서적
2019
[49]
서적
1998, 1999
[50]
서적
1975
[51]
서적
2009
[52]
서적
2007
[53]
서적
1981
[54]
서적
2018
[55]
서적
Laboratory of Justice: The Supreme Court's 200-Year Struggle to Integrate Science and the Law
https://archive.org/[...]
Henry Holt
2005
[56]
간행물
Scope and Purpose of Sociological Jurisprudence
https://www.jstor.or[...]
1910
[57]
간행물
Legal Realism, Sociological Jurisprudence and Mr. Justice Holmes
https://www.jstor.or[...]
1965
[58]
서적
2002
[59]
서적
2009
[60]
서적
2009
[61]
서적
1997
[62]
서적
1976
[63]
서적
2001
[64]
서적
2001
[65]
서적
1976
[66]
서적
1997, 2005, 1979
[67]
서적
2005
[68]
서적
1963
[69]
서적
1982, 1983
[70]
서적
1976
[71]
서적
1981
[72]
서적
1979
[73]
서적
1983
[74]
서적
1988
[75]
서적
2001
[76]
서적
1994
[77]
서적
1997, 1999
[78]
서적
2004, 2007, 2009
[79]
서적
2006, 2008
[80]
서적
2006, 2013
[81]
논문
Eyes of the Law: A Visual Turn in Socio-Legal Studies?
2017
[82]
서적
2009
[83]
서적
2005
[84]
서적
2019
[85]
서적
2000, 1988, 1989, 1986, 2009
[86]
서적
2005, 1986
[87]
서적
1990
[88]
웹사이트
https://ssrn.com/abs[...]
2011
[89]
서적
2007, 2009
[90]
서적
1988
[91]
서적
1988
[92]
서적
2002
[93]
서적
1986
[94]
서적
2003
[95]
서적
2001
[96]
서적
2006
[97]
서적
2008
[98]
서적
1986
[99]
서적
2008
[100]
서적
2002
[101]
서적
1993, 1999
[102]
서적
1986
[103]
서적
1981
[104]
서적
2008
[105]
서적
2006
[106]
논문
1980
[107]
논문
2002
[108]
논문
2004
[109]
논문
2005
[110]
논문
1995
[111]
논문
2006
[112]
논문
2004
[113]
논문
2007
[114]
논문
1975
[115]
논문
1975
[116]
논문
2002
[117]
논문
1996
[118]
논문
1998
[119]
논문
1996
[120]
논문
2006
[121]
논문
1996, 2007, 2003
[122]
웹사이트
RCSL
http://rcsl.iscte.pt[...]
[123]
서적 #추정
농촌법률문제, 嘘の効用
[124]
서적 #추정
법률과 慣習―日本的法理探求の方法に関する一考察, 物権法上巻
[125]
서적 #추정
法社会学
[126]
웹인용
루만, 니클라스. (2015). 법사회학.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https://www.dbpia.co[...]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12-25
[127]
웹인용
막스 베버의 R. 슈탐러 비판과 법사회학 기초
https://www.dbpia.co[...]
법과사회이론학회
2018
[128]
웹인용
(제2판) 현대사회와 법
https://www.dbpia.co[...]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12
[129]
웹인용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기본원칙
https://www.dbpia.co[...]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03
[130]
웹인용
사회이론적 비판과 사회과학적 설명
https://www.dbpia.co[...]
새한철학회
1999-12
[131]
웹인용
니체 철학에서 허무주의의 도래와 극복 : 진실성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가톨릭대학교
2021
[132]
웹인용
간접민주주의와 문화적 차별의 재생산
https://www.dbpia.co[...]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4-03
[133]
웹인용
연대기 문학의 시기별 특성과 변화 - 아메리카와 원주민, 정복사를 중심으로 -
https://www.dbpia.co[...]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23-12
[134]
웹인용
현대 법학에 있어서 법의 발견과 법사회학
https://www.dbpia.co[...]
한국법학회
2010-05
[135]
웹인용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 소설로서의 『매직 토이숍』 읽기
https://www.dbpia.co[...]
신영어영문학회
2024-02
[136]
웹인용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혐오와 사회권
https://www.dbpia.co[...]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04
[137]
웹인용
사회보험의 확장 - 한국사회보장법학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2023년도 가을 공동 정기학술대회 참관기 -
https://www.dbpia.co[...]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12
[138]
웹인용
영국의 법사회학 -개념, 역사, 현황-
https://www.dbpia.co[...]
법과사회이론학회
2008
[139]
웹인용
문화계발 효과이론에 있어서 수용자관
https://www.dbpia.co[...]
한국언론학회
1992-01
[140]
뉴스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한류 및 법개발협력 방안 등 논의
https://www.kyosu.ne[...]
교수신문
2024-06-19
[141]
웹인용
수행문에서 상징권력으로: 피에르 부르디외의 화행이론 해석을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한국사회학회
2023-06
[142]
웹인용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의 방법론적 조형
https://www.dbpia.co[...]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04
[143]
웹인용
법철학에서 관습이 왜 중요한가?―관습의 본질과 법규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https://www.dbpia.co[...]
한국법철학회
2021-08
[144]
웹인용
비서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읽는 법
https://www.dbpia.co[...]
한국이론사회학회
2014-11
[145]
웹인용
자율규제와 법다원주의
https://www.dbpia.co[...]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06
[146]
웹인용
법실증주의와 그 재판이론
https://www.dbpia.co[...]
한국법철학회
2011-12
[147]
웹인용
2012년도 종교법 판례의 동향
https://www.dbpia.co[...]
종교문화비평학회
2013
[148]
웹인용
[법무뉴스] 법관대표회의, ‘권역법관 제도’ 시행 건의
https://www.dbpia.co[...]
고시계 전문잡지
2018-04
[149]
웹인용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https://www.dbpia.co[...]
한국법철학회
2019-08
[150]
웹인용
‘국민을 위한 법’ 만들고 해석해 정부 입법까지 이끄는 법제처 변호사들
https://www.dbpia.co[...]
고시계 전문잡지
2023-08
[151]
웹인용
효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법적 보완 방안
https://www.dbpia.co[...]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08
[152]
웹인용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권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적 접근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 개념
https://www.dbpia.co[...]
한국법철학회
2019-08
[153]
웹인용
페미니즘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https://www.dbpia.co[...]
한반도선진화재단
2023-09
[154]
웹인용
세계화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정체성
https://www.dbpia.c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6-08
[155]
웹인용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미디어 경영과 경제학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8-08
[156]
웹인용
‘우리가 살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
https://www.dbpia.co[...]
오늘의 문예비평
2021-12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