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에 노부타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고노에 노부타다는 1565년에 태어나 1614년에 사망한 일본의 귀족으로, 내대신, 좌대신을 거쳐 1605년 간파쿠에 올랐다. 그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관례를 받고 이름을 하사받았으며, 혼노지의 변 당시 아버지와 함께 혼노지에 있었다. 1585년 간파쿠 자리를 두고 니조 아키자네와 갈등을 겪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간파쿠가 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이후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에 연루되어 유배 생활을 겪었다. 유배 기간 동안 서도에 눈을 뜨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쳤으며, 말년에는 간파쿠를 역임했지만 과음으로 사망했다. 그는 서예, 와카 등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으며, 특히 서도는 '간에이의 삼필'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공가 - 고노에 사키히사
고노에 사키히사는 센고쿠 시대부터 에도 시대 초기의 공경으로, 후지와라 씨의 명문가 고노에 가문 출신이며 관백과 태정대신 등의 고위 관직을 역임했고, 와카와 렌가에 능했으며, 오다 노부나가와의 교류, 혼노지의 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백 취임 등 격동의 시대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공가 - 이치조 우치모토
이치조 우치모토는 센고쿠 시대부터 에도 시대 초기의 공경으로, 토사 이치조씨 내분 수습을 위해 토사국으로 하향하기도 했으며, 고요제이 천황의 황자를 양자로 들여 이치조 가문을 황별섭가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 에도 시대의 공가 - 다카쓰카사 노부코
다카쓰카사 노부코는 도쿠가와 마사코를 고미즈오 천황의 중궁으로 삼는 데 관여하고, 도쿠가와 쓰나요시와 결혼하여 에도 성 오오쿠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일화를 남겼으며, 쓰나요시 사후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 - 에도 시대의 공가 - 고노에 사키히사
고노에 사키히사는 센고쿠 시대부터 에도 시대 초기의 공경으로, 후지와라 씨의 명문가 고노에 가문 출신이며 관백과 태정대신 등의 고위 관직을 역임했고, 와카와 렌가에 능했으며, 오다 노부나가와의 교류, 혼노지의 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백 취임 등 격동의 시대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 1565년 출생 - 김예직
김예직은 조선 중기 무신으로,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의 동생이며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했고 무과 급제 후 여러 관직을 역임했으며 광해군 시대 탄핵을 받았으나 인조반정 이후 포상을 받았고 김종필의 12대 조상이다. - 1565년 출생 - 멍거불루
멍거불루는 1360년경 건국된 하대의 국주로, 명나라 개입과 건주 여진과의 갈등, 내부 분열을 겪으며 누르하치에게 멸망당했다.
| 고노에 노부타다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고노에 노부타다 |
| 일본어 표기 | 近衛 信尹 |
| 시대 |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 에도 시대 초기 |
| 출생 | 에이로쿠 8년 11월 1일 (1565년11월 23일) |
| 사망 | 게이초 19년 11월 25일 (1614년12월 25일) |
| 개명 | 아키마루 (유명) → 노부모토 (초명) → 노부스케 → 노부타다 |
| 시호 | 삼묘인 |
| 계명 | 알 수 없음 |
| 묘소 | 알 수 없음 |
| 관위 | 종1위, 간파쿠, 준삼궁, 좌대신 |
| 섬긴 천황 | 오기마치 천황 → 고요제이 천황 → 고미즈노오 천황 |
| 씨족 | 고노에 가문 |
| 부모 | 아버지: 고노에 사키히사, 어머니: 하타노 소시치의 딸 |
| 형제자매 | 노부타다, 존세이, 호코인, 사키코, 고쇼인 |
| 배우자 | 알 수 없음 |
| 자녀 | 타로히메, 노부히로 정실, 양자: 노부히로 |
| 특기 사항 | 알 수 없음 |
| 관직 이력 | |
| 관백 임기 시작 | 1605년 |
| 관백 임기 종료 | 1606년 |
| 가문 정보 | |
| 당주 | 고노에 가문 17대 당주 |
| 전임 당주 | 고노에 사키히사 |
| 후임 당주 | 고노에 노부히로 |
2. 생애
1565년(에이로쿠 8년) 11월 1일, 고노에 사키히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아명은 아키마루이다.
1577년(덴쇼 5년), 오다 노부나가가 주관한 원복을 치렀고, 노부나가에게 한 글자를 받아 노부모토(信基)라고 이름 지었다.
1580년(덴쇼 8년), 나이다이진이 되었다.
1582년(덴쇼 10년) 5월 29일, 노부나가가 모리 데루모토 토벌을 위해 상경하자, 6월 1일에 아버지 사키히사 및 다른 공경들과 함께 혼노지를 방문했다. 다음 날인 2일, 혼노지의 변이 발생하여 노부나가는 급사했다.
1585년(덴쇼 13년) 5월, 사다이진이 되었으나, 같은 달 간파쿠 자리를 두고 니조 아키자네와 다투었다(간파쿠 상론). 키쿠테이 하루스케의 책동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관백 취임의 빌미를 주었다. 그 결과 7월에 아키자네가 관백을 사임하고 히데요시가 관백이 되었다.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쓰구에게 관백 자리를 물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공가 사회에서 고립되어 "마음의 병"에 시달리게 되자, 1592년 정월에 좌대신을 사임했다.
1592년(분로쿠 원년), 히데요시가 조선 출병을 일으키자, 같은 해 12월에 자신도 조선반도로 건너가기 위해 히젠국나고야성으로 향했다. 고요제이 천황은 이를 우려하여 칙서를 내려 노부타다의 도해를 막으려 했다. 조정 신하로서는 지나치게 분방한 행동이었고, 키쿠테이 하루스케 등이 참언[2]했기 때문에 천황과 히데요시의 노여움을 사, 1594년(분로쿠 3년) 4월에 칙찬을 받았다.
고노에 가문의 장원이 있던 사쓰마국의 보노쓰에 3년간 유배되었고[3], 그 사이의 사정을 일기 『산먀쿠인기』에 상세히 기술했다. 시마즈 요시히사로부터 후한 대우를 받았으며, 교토로 돌아올 무렵에는 1, 2년 더 있고 싶다는 서한을 남길 정도였다[6].
1596년(게이초 원년) 9월, 칙허를 받아 교토로 돌아왔다.
1600년(게이초 5년) 9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한 시마즈 요시히로의 가신들을 몰래 보호해주었다. 아버지 사키히사도 사쓰마 유배 경험이 있었고, 세키가하라에서 패배한 시마즈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과의 교섭을 중개하여[7],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영지 안도를 확약받았다.
1601년(게이초 6년), 좌대신으로 복직했다.
1605년(게이초 10년) 7월 23일, 염원하던 관백이 되었지만, 다음 해인 1606년 11월 11일에 타카츠카사 노부후사에게 관백을 물려주고 사임했다. 이는 히데요시 이후 정체되었던 조정 인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614년 11월 25일, 과음을 원인으로 하는 병으로 훙거, 향년 50세. 야마시로국(교토) 도후쿠지에 묻혔다. 서자밖에 없었으므로[8], 고요제이 천황 제4 황자를 후계로 선택하여, 고노에 노부히로로 이름을 잇게 하고, 자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다.
노부타다는 조상인 후지와라노 미치나가가 적은 『미도 간파쿠기』의 일부를 발췌하여 자필본 5권을 보관하였다. 이 발췌본은 嗣子인 고노에 노부히로가 발견하고 표지에 기록을 남겼다고 한다.[9]
2. 1. 가문과 초기 생애
고노에 사키히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머니는 하타노 소시치의 딸이다.[2] 유아명은 아키마루(昭麿)였다.[3]1577년(덴쇼 5년), 오다 노부나가의 주관 하에 겐푸쿠(元服)를 치르고 노부모토(信基)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후 노부스케(信輔)로 개명했다.[4] 1580년(덴쇼 8년), 나이다이진(内大臣)에 임명되었다.[5] 1582년(덴쇼 10년)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 당시 아버지 사키히사와 함께 혼노지에 있었다.[6] 1585년(덴쇼 13년) 5월, 사다이진(左大臣)에 임명되었다.[7]
2. 2. 간파쿠 상론(関白相論)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1585년(덴쇼 13년) 5월, 노부타다는 좌대신이 되었으나, 같은 달 간파쿠 자리를 두고 현직 간파쿠인 니조 아키자네와 갈등을 빚었다. 이를 '간파쿠 상론(간파쿠 상론)'이라 한다. 기쿠테이 하루스케의 책동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간파쿠에 취임하는 계기가 되었다.[2]당시 조정은 노부타다를 니조 아키자네의 후임 간파쿠로 임명하려 했으나, 두 사람은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히데요시를 방문하여 각자의 의견을 정당화했고, 그 결과 히데요시는 조정이 원래 그에게 주려 했던 좌대신 대신 간파쿠 지위를 요구했다. 히데요시는 세케 출신만이 간파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부타다의 아버지 고노에 사키히사에게 입양을 요청했고, 노부타다가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간파쿠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1591년 히데요시의 조카인 도요토미 히데쓰구가 간파쿠가 되었다. 이에 노부타다는 크게 실망하여 그 해 좌대신에서 사임하고 은퇴했다. 히데요시가 히데쓰구에게 간파쿠직을 물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노부타다는 공가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점차 "마음의 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2. 3. 조선 출병(임진왜란)과 유배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임진왜란)에 참전하기 위해 히젠국나고야성으로 향했다. 고요제이 천황은 칙서를 히데요시에게 내려 노부타다의 조선행을 막으려 했으나, 지나치게 분방한 행동과 키쿠테이 하루스케 등의 참언[2]으로 천황과 히데요시의 노여움을 사, 1594년 4월에 고요제이 천황의 칙찬을 받았다.고노에 가문이 장원을 가지고 있던 사쓰마국의 보노쓰 (현재 미나미사쓰마시 보노쓰초)에 3년간 배류되었고[3], 그 사이의 사정을 일기 『산먀쿠인기』에 상세히 기술했다. 교토에서 45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보의 어참가옥 (현재 류간지 일대)에 체류하며, 여러 곳을 산책하고, 보노쓰 팔경 (와카에 읊어진 쌍검석 일대는 국가 명승으로 지정[4]), 마쿠라자키·가고시마 팔경 등의 와카를 읊었다. 고향에 친숙해지며 서화를 가르치고, 호제돈(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소교토풍 12관녀)의 가을 축제나 어소의 말, 도쿄의 문화를 전파했다. 가고시마의 대표적인 민요 『한야부시』의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서도에 눈을 떴다고 한다[5]. 배류 중 시중을 들었던 어참가옥 지킴이아쓰카이미야타 타지마노카미 무네요시의 후손들은 "신"을 대대로 통자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고노에 저택 터는 고노에 공원이 되었고, 고노에 후미마로에 의한 비석도 건립되었으며, 손으로 심은 등나무는 계절에 꽃을 피운다. 멀리 사쓰마에서의 생활은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마즈 요시히사로부터 후한 대우를 받았으며, 교토로 돌아올 무렵에는 1, 2년 더 있고 싶다는 서한을 남길 정도였다[6].
1596년 9월, 칙허가 내려 교토로 돌아왔다.
2. 4. 귀환과 간파쿠 취임
1596년(게이초 원년) 9월, 고요제이 천황의 칙허를 받아 교토로 돌아왔다.[2] 1601년(게이초 6년), 좌대신으로 복직했다. 1605년(게이초 10년) 7월 23일, 염원하던 관백이 되었지만, 다음 해인 1606년 11월 11일에 타카츠카사 노부후사에게 관백직을 양위하고 사임했다. 이처럼 잦은 관백 교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 정체되었던 조정 인사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2. 5. 사망
慶長일본어 19년(1614년) 11월 25일, 과음으로 인한 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50세.[8] 야마시로국(교토) 도후쿠지에 묻혔다. 서자(庶子)밖에 없어 고요제이 천황의 넷째 황자(고노에 노부히로)를 양자로 삼았다.[8]3. 인물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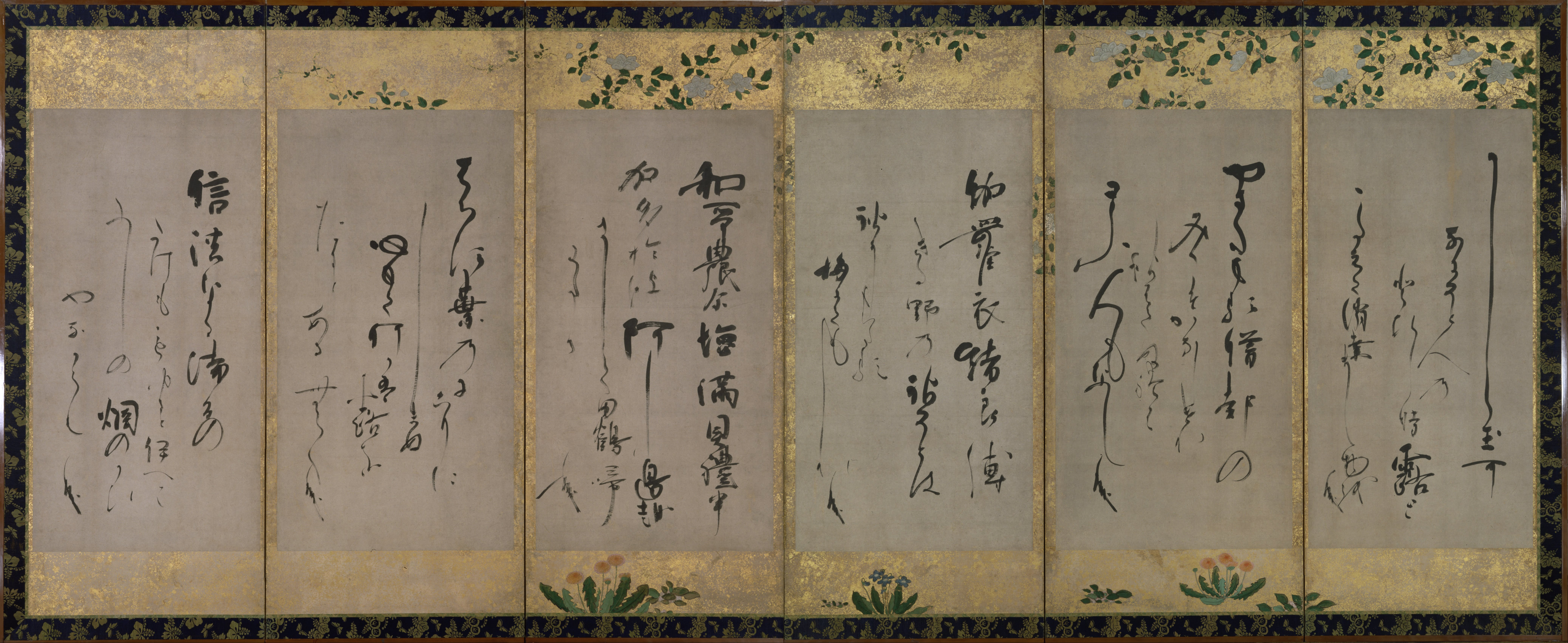
서예, 와카, 렌가, 회화 등 여러 예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특히 서도는 쇼렌인류를 배우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고노에류 또는 삼묘원류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서체를 확립하였다. 사쓰마로 유배된 후에는 서풍이 변화하였다. 혼아미 코에츠, 쇼카도 쇼조와 함께 '간에이의 삼필'로 불리며 후대에 능서로 칭송받았다. 또한, 렌가 동료인 구로다 나가마사에게 보낸 서찰도 아름다운 필치로 쓰여졌으며, 나가마사가 지쿠젠 후쿠오카로 이주하는 아쉬운 마음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방에서 지냈고, 교토로 돌아온 후에도 공가보다는 노부나가의 고쇼 등과 친하게 지내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무사를 동경했다고 한다.[10]
4. 가계
wikitext
| 항목 | 내용 |
|---|---|
| 아버지 | 고노에 사키히사 |
| 어머니 | 하타노 소시치의 딸 |
| 아내 | 불명 |
| 생모 불명의 자녀 | |
| 양자 |
5. 관련 인물
- 오다 노부나가 : 1577년(덴쇼 5년) 노부타다의 겐푸쿠 의식을 주관하고,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信)를 하사했다.[2]
- 도요토미 히데요시 : 1585년(덴쇼 13년) 간파쿠 자리를 두고 니조 아키자네와 다툼(간파쿠 상론)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히데요시가 간파쿠에 취임하는 계기가 되었다.[2]
- 고요제이 천황 : 조선 출병을 위해 히젠국나고야성으로 향하려던 노부타다를 칙서를 내려 막으려 했다. 이후 노부타다의 분방한 행동과 키쿠테이 하루스케 등의 참언으로 1594년(분로쿠 3년) 4월에 칙찬을 내려 사쓰마국 보노쓰에 유배 보냈으나,[3] 1596년(게이초 원년) 9월에 귀환을 허락했다.
- 시마즈 요시히사 : 유배 중인 노부타다를 후대했다.[6] 교토로 돌아갈 무렵에는 1, 2년 더 있고 싶다는 서한을 남길 정도였다.
- 혼아미 고에쓰, 쇼카도 쇼조 : 서도에 능했던 노부타다와 함께 '간에이의 삼필'로 불리는 서예가들이다.
- 구로다 나가마사 : 렌가 동료로, 나가마사에게 보낸 서찰은 아름다운 필치로 쓰여졌으며, 나가마사가 지쿠젠국 후쿠오카로 이주하는 아쉬운 정을 담고 있다.
6. 평가 및 현대적 의의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 출력과 원본 소스, 요약 등을 제공해주시면 지침에 따라 수정하여 출력하겠습니다.)
참조
[1]
Kotobank
近衛信尹
2023-03-26
[2]
문서
[3]
문서
[4]
문서
[5]
문서
[6]
문서
[7]
문서
[8]
문서
[9]
간행물
史料紹介・『御堂関白記』自筆本の裏に写された『後深心院関白記』
[10]
문서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