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피로증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전투피로증은 전투 상황에서 병사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셸 쇼크(Shell Shock)로 처음 명명되었으며, 이후 전쟁 신경증, 전투 피로, 전투 스트레스 반응(CSR) 등으로 불리며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투 피로 반응은 공격 충동, 불안, 피로감, 기억 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며, 환경적, 생리적, 정신적, 군사적, 인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진단과 치료는 PIE 또는 BICEPS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적절한 치료를 통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지만, PTSD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있다. 각국은 전투피로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에서 다양한 사례와 치료법이 연구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군진의학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 의학적 장애로, 사건의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리적 외상과 회복력이 발병 및 극복에 영향을 미친다. - 군진의학 - 잠수의학
잠수의학은 잠수 활동과 관련된 의학적 질환, 수중 환경 생리학, 잠수 장비 및 안전 절차를 연구하며, 고압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잠수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다룬다. - 전쟁의 여파 - 탈산림화
탈산림화는 인위적·자연적 원인으로 산림이 다른 용도로 바뀌는 현상으로, 열대우림 면적 감소와 생물다양성 손실,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며 농업, 목재 산업, 광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 전쟁의 여파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 의학적 장애로, 사건의 재경험, 회피,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리적 외상과 회복력이 발병 및 극복에 영향을 미친다. - 불안 장애 - 광장공포증
광장공포증은 공황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그러한 장소를 회피하는 불안 장애로, 심계항진, 맥박 가속, 발한 등의 신체적 증상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공포를 동반하며,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인지행동치료나 약물 치료 등의 치료법이 존재하며,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 - 불안 장애 - 친밀감에 대한 공포
친밀감에 대한 공포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개인 정보 공유, 정서적 반응, 타인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되며, 유년기 경험과 학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여러 관계를 맺거나 감정 표현의 어려움 등의 징후를 보이며, 불확실성 수용, 자기 연민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전투피로증 | |
|---|---|
| 개요 | |
 | |
| 일반 정보 | |
| 분야 | 정신 의학 |
| 정의 | |
| 설명 | 전쟁의 외상으로 인한 행동 장애 |
2. 용어의 역사
전투 스트레스 반응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다.
제1차 세계 대전 초기에는 '''셸 쇼크(Shell Shock)'''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참호전의 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포격과 관계없이 장기간 전투로도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쟁 신경증'''(war neurosis영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을 관찰하며 반복적인 외상성 악몽에 대해 연구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는 '''전투 피로'''(combat fatigue영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투 기간이 길어지면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병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전쟁에서는 전투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손실은 감소하고, '''정신병적 손해''' (psychiatric casualities영어)라는 명칭으로 전투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8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전투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만성적인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2. 1. 쉘 쇼크 (Shell Shock)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참호전의 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충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1922년 영국 정부는 '전쟁 쇼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고, 여기에는 치료 방법과 전투 복귀 조건 등이 담겨 있었다.[8]1939년까지 약 12만 명의 영국 참전 용사들이 주요 정신과적 장애로 보상을 받았거나 연금을 받고 있었다. 종군 기자 필립 깁스(Philip Gibbs)는 참전 용사들이 겪는 변화와 고통에 대해 기록했다.[8] 한편, 기능적 신경 장애에 대한 보상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8]
군의관들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병사들의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하며, 포격으로 인한 이러한 증상을 쉘 쇼크(shell shock영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 포격과 관계없이 장기간 전투로도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쟁 신경증 (war neurosis영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병사들의 관찰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외상성 악몽에 대해 연구했다.
2. 2. 전쟁 신경증 (War Neurosis)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병사의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한 군의관들은 참호에 대한 포격과 폭음으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셸 쇼크(shell shock영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 포격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전투로도 증상이 나타나면서 전쟁 신경증 (war neurosis영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5]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병사들의 관찰을 바탕으로 반복 강박적인 외상성 악몽에 대해 연구했다.제2차 세계 대전에는 전투 피로 (combat fatigue영어)라고도 불렸으며, 전투 기간이 길어지면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병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전투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을 '''전쟁 신경증'''으로 번역했다. 1938년 육군성 의사과장은 귀족원에서 "구미의 군대에는 전쟁 신경증이 한 명도 발병하지 않는 것이 황군의 자랑"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고후다이 병원 등에서 다수의 병사가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다.[36]
2. 3. 전투 피로 (Combat Fatigue)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러 전투 피로(영어: combat fatigue)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전투 기간이 길어지면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병사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시기, 일본에서는 전투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을 '전쟁 신경증'으로 번역했다. 1938년 육군성 의사과장은 귀족원에서 "구미의 군대에 많은 전쟁 신경증이 한 명도 발병하지 않는 것이 황군의 자랑"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고후다이 병원 등에서 다수의 병사가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다.[35][36]
2. 4. 전투 스트레스 반응 (Combat Stress Reaction, CSR)
현대에 사용되는 용어인 전투 스트레스 반응(Combat Stress Reaction, CSR)은 전투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포괄한다. 전투 피로 반응의 증상은 정신적 외상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투 피로 반응은 PTSD와는 달리 PTSD 진단을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증상 지속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전투 피로 관련 사상자 비율은 전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치열한 전투에서는 1:1까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낮은 강도의 분쟁에서는 1:10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진다. 현대 전쟁은 더 높은 전투 스트레스 사상자를 예상하며, 지속적인 작전의 원칙을 구현한다.[4]
제2차 세계 대전 유럽 전선의 군대에서 연간 1,000명당 101명 (1:10)의 스트레스 관련 사상자 비율은 전쟁 말기의 낮은 비율 데이터로 인해 평균 및 최고점에서 낮게 왜곡되었다.[5]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미국 군대의 대부분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치료 교훈을 잊고 있었다. 지원자 선별은 처음에는 엄격했지만, 경험상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결국 드러났다.
미국은 1941년 12월에 전쟁에 참전했다. 각 사단 조직표에 정신과 의사가 추가된 것은 1943년 11월이었으며, 이 정책은 지중해 전역에서는 1944년 3월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1943년까지 미 육군은 정신과 사례에 대한 초기 진단으로 "피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군 정신의학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지 패튼의 조지 S. 패튼 뺨 때리기 사건은 부분적으로 1943년 9월 이탈리아 침공에 대한 전방 치료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대 응집력과 집단 소속이 보호 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존 애플은 이탈리아 주둔 미군 보병의 평균적인 피로도가 200~240일 만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국 군인은 "전우를 위해 싸우거나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몇 달간의 전투 이후, 군인은 전투에서 용기를 증명했고 함께 훈련받았던 대부분의 전우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부족했다. 애플은 군인들의 현역 전투 기간을 180일로 제한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도왔고,[9] 전쟁의 의미를 더 강조하여, 적들이 미국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의 가족에게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며 싸우도록 격려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정신과 의사들은 집에서 온 편지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군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불필요하게 언급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믿었다. 윌리엄 메닝거는 전쟁 후 "군인에게 편지 쓰기 교육 과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명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에드워드 스트레커는 아들들을 "젖 떼는 데" 실패한 후 편지를 통해 사기를 훼손하는 "엄마들" (친모와 반대되는 의미)을 비판했다.[10]
비행사들은 유럽보다 남서 태평양에서 훨씬 더 자주 비행했고, 호주에서 휴식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유럽에서와 같이 전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정된 임무 수는 없었다. 단조롭고 덥고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과 결합되어, 이는 베테랑들이 신참들에게 빠르게 전파하는 좋지 않은 사기를 초래했다. 몇 달 후, 전투 피로의 유행은 부대의 효율성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항공 외과 의사들은 정글 비행장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했다.
> 많은 사람들이 만성 이질이나 다른 질병을 앓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성 피로 상태를 보인다. ... 그들은 무기력하고, 초췌하며,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며, 얼굴 표정은 거의 가면과 같다. 말은 느리고, 사고 내용은 빈약하며, 만성 두통, 불면증, 기억력 결함을 호소하고, 잊혀졌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새로운 임무를 두려워하며, 책임감이 없고, 미래에 대해 절망한다.[11]
제1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굳게 지킨 것은 미국과 달리 영국 지도부였다. 항공 폭격으로 하루 최대 35,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되었지만, 블리츠 기간 동안 총 40,000명만 사망했다. 예상했던 민간인의 정신적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제1차 세계 대전의 의사들에게 의존했다. PIE 원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영국군에서는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의사들의 대부분이 너무 고령이어서 젊고 분석적인 훈련을 받은 정신과 의사들이 고용되었다. 군의관들은 "전시 붕괴와 그 치료에 대한 개념이 없는 듯했지만, 그들 중 다수는 1914~1918년 전쟁에 참전했다." 1942년에 최초의 중동군 정신과 병원이 설립되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된 첫 달 동안 부상병을 영국 해협을 건너 돌려보내기 전에 48시간 동안만 붙잡아두는 정책이 있었다. 이것은 PIE의 기대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8]
애플은 영국군이 미국군보다 거의 두 배나 더 오래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군이 더 나은 순환 일정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과 달리 "생존을 위해 싸우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영국군에게 추축국의 위협은 영국이 유럽 본토와 가깝고, 독일이 동시에 공습과 영국 산업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의사들은 집에서 온 편지가 종종 병사들의 사기를 불필요하게 손상시킨다고 믿었다.
캐나다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전투 피로"로 인식하고 이를 별도의 유형의 전투 부상으로 분류했다. 역사학자 테리 코프는 이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다.[12] 노르망디에서 "전투에 참여한 보병 부대 또한 전투 스트레스에 따른 전투 피로 환자 수가 급증했으며, 수백 명의 병사가 전투 스트레스로 인해 후송되었다. 연대 군의관들은 정교한 선발 방법이나 광범위한 훈련으로는 상당수의 전투 병사가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13]
로버트 G. L. 웨이트의 저서 《나치즘의 선구자》에서 나치 이전의 자유군단 준군사 조직의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학자인 웨이트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독일 군인들에게 미친 몇 가지 정서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헤르만 괴링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가 언급한 "비잔혹해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구절을 언급했다.[14]
루돌프 브리켄슈타인 박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그는 높은 수준의 리더십으로 스트레스 붕괴로 인한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병사가 붕괴되어 계속 싸울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의무병이나 정신과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붕괴(그는 말했다)는 대개 싸우려는 의지 부족이나 비겁함의 형태로 나타났다.[15]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면서 1935년 입원 환자의 1%에서 1942년 6%로 스트레스 관련 사상자가 급증했다. 또 다른 독일 정신과 의사는 전쟁 후, 엔젠에서 마지막 2년 동안 입원 환자의 약 3분의 1이 전쟁 신경증 때문이었다고 보고했다. 실제 문제의 심각성은 덜했고, 문제에 대한 인식도 덜했을 가능성이 크다.[15]
핀란드의 "전투 피로"에 대한 태도는 특히 엄격했다. 군의관장이었던 정신과 의사 해리 페더리는 쉘 쇼크를 나약한 성격과 도덕성의 결여로 간주했다. 그의 전투 피로 치료법은 간단했다. 환자들은 최전선으로 복귀할 때까지 괴롭힘과 학대를 받아야 했다.
이보다 앞서, 겨울 전쟁 동안 카렐리안 지협 전선의 여러 핀란드 기관총 사수들은 요새화된 핀란드 진지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실패한 소련군의 인해전술 공격을 격퇴한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군사 심리학 및 군사 의학 연구에서는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전투를 경험한 병사가 겪는 다양한 반응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심리적 장애(심신증)로 정의한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병사의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한 군의관은 폭음을 동반하는 참호에 대한 포격으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증상을 셸 쇼크(shell shock영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 포격과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친 전투로도 반응이 나타나면서 전쟁 신경증 (war neurosis영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병사들의 관찰을 바탕으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적인 외상성 악몽에 대해 연구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 이르러, 전투 피로 (combat fatigue영어)라고도 불리며, 전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병사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전투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을 '''전쟁 신경증'''으로 번역했다. 1938년, 육군성 의사과장은 귀족원에서 "구미의 군대에 많은 전쟁 신경증이 한 명도 발병하지 않는 것이 황군의 자랑"이라고 답변했지만, 그 이면에는 육군 고후다이 병원 등 다수의 병사가 수용되어 치료를 받았다.[35][36]
한국 전쟁에서는, 종래와 같은 전투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손실은 감소하고, 정신병적 손해 (psychiatric casualities영어)라는 명칭으로 전투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병사가 평가되는 것이 통례가 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은 전투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전적인 전투 스트레스 반응에서 새로운 후유증으로 옮겨가게 된다.
1980년대에 걸쳐 베트남 전쟁 참전 베트남 귀환 병사가 사회 복귀 후에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보이는 것이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명명되었다.
2.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베트남 전쟁 이후, 전투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만성적인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투 피로 반응은 PTSD와 증상이 유사하지만, PTSD 진단을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증상 지속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8]1922년 영국 정부는 "전쟁 쇼크"에 대한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방, 신경 센터, 기지 병원에서의 치료 지침과 치료 형태, 전투선 복귀 조건 등을 제시했다. 당시 영국은 많은 참전 용사들이 연금을 받고 장기적인 장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8]
종군 기자 필립 깁스는 참전 용사들이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절과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변했다고 기록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 이상한 성질, 깊은 임상 우울증과 쾌락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보였고, 쉽게 정열(감정)에 휩싸여 자기 통제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8]
제1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셸 쇼크(shell shock|셸 쇼크영어)라고 불렀으나, 이후 포격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전투로도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져 전쟁 신경증 (war neurosis|전쟁 신경증영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 병사들의 관찰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외상성 악몽에 대해 연구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는 전투 피로 (combat fatigue|전투 피로영어)라고도 불렸으며, 전투 기간이 길어지면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병사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전투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을 '''전쟁 신경증'''으로 번역했다. 1938년 육군성 의사과장은 귀족원에서 "구미의 군대에 많은 전쟁 신경증이 한 명도 발병하지 않는 것이 황군의 자랑"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병사들이 육군 고후다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35][36]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전투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손실은 감소하고, 정신병적 손해 (psychiatric casualities|정신병적 손해영어)라는 명칭으로 관련 증상을 보이는 병사를 평가했다.
1980년대 베트남 전쟁 참전 베트남 귀환 병사들이 사회 복귀 후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보이는 것이 연구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영어, PTSD)로 명명되었다.
3. 원인 및 증상
전투 스트레스 반응(CSR)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광범위한 증상을 보인다. CSR은 정신적 외상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PTSD 진단을 위해서는 한 달 이상의 증상 지속 기간이 필요한 반면, CSR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4]
CSR 환자가 초기에 경험하는 많은 증상은 인체의 투쟁-도피 반응의 장기적인 활성화로 인한 것이다.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카테콜아민 호르몬은 격렬한 근육 활동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위협이 제거되면 투쟁-도피 반응이 끝나지만, 전투 지역의 끊임없는 치명적인 위험은 병사들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한다.[17]
인체가 연장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과정을 일반적응증후군(GAS)이라고 한다. 초기 투쟁-도피 반응 후, 신체는 교감 신경 반응을 억제하고 항상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트레스에 더 저항하게 된다. 이 저항 기간 동안 CSR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전투 참여는 신체가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여 자원을 고갈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만들어 GAS의 세 번째 단계인 소진으로 이끌 수 있다. 교감 신경 활성은 소진 단계에 남아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투쟁-도피 증상이 돌아오면서 현저하게 민감해진다. 신체가 스트레스 상태에 남아 있으면 심혈관 및 소화기 관련 등 CSR의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장된 소진은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18]
전투피로 관련 사상자 비율은 전투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치열한 전투에서는 1:1까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낮은 강도의 분쟁에서는 1:10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진다.[4] 제2차 세계 대전 유럽 전선의 미군에서는 연간 1,000명당 101명(1:10)의 스트레스 관련 사상자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쟁 말기의 낮은 비율 데이터로 인해 평균 및 최고점에서 낮게 왜곡된 수치이다.[5]
1922년 영국 정부는 "전쟁 쇼크"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치료 형태와 전투선 복귀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다. 또한 많은 영국 참전 용사들이 장기적인 장애로 연금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8] 제1차 세계 대전 종군 기자였던 필립 깁스는 참전 용사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정신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기록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미국 군대의 대부분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치료 교훈을 잊고 있었다. 조지 S. 패튼의 조지 S. 패튼 뺨 때리기 사건은 1943년 이탈리아 침공에 대한 전방 치료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대 응집력과 집단 소속이 보호 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9]
존 애플은 이탈리아 주둔 미군 보병의 평균적인 피로도가 200~240일 만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국 군인은 "전우를 위해 싸우거나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9]
3. 1. 스트레스 요인
전투피로증의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환경적, 생리적, 정신적, 군사적, 인격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적 요인: 기온, 기상, 습도, 소음, 그리고 핵무기나 생물 무기·화학 무기에 의한 오염 등이 있다.[17]
- 생리적 요인: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 기아, 체온 저하, 탈수 등이 있다.[17]
- 정신적 요인: 공포감, 부상, 구속, 폭력, 사기 저하, 지휘관이나 부대에 대한 불신감 등이 있다.[17]
- 군사적 요인: 전투로 인한 손실, 적의 기습, 전장의 불확실성, 인원 및 장비 부족 등이 있다.[17]
- 인격적 요인: 건강상의 걱정, 경제적 문제, 심리적 외상, 죄책감, 인격적 경향 등이 있다.[17]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 중 어떤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는 육해공군의 군종, 그리고 개별 병사의 직종이나 직역, 부대의 숙련도 및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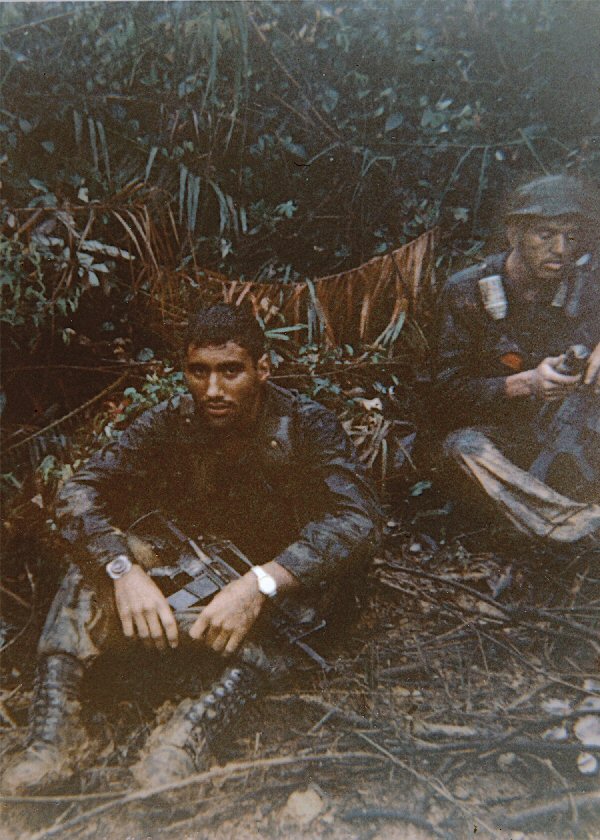
평화 유지 활동은 군인들이 훈련받은 역할에 초점을 맞춘 교전 규칙 때문에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격 또는 경험이 있다.[16]
- 끊임없는 긴장과 분쟁의 위협.
- 지뢰 및 부비 트랩의 위협.
- 심각하게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들과의 근접 접촉.
- 민간인을 포함할 수 있는 고의적인 학대와 잔혹 행위.
- 문화적 문제.
- 분리 및 가정 문제.
- HIV를 포함한 질병의 위험.
- 유해 물질 노출의 위협.
- 임무 관련 문제.
- 복귀 후의 문제.
제2차 세계 대전 연구에서 소속 부대에 대한 동지애와 자부심이 "평균 이상"이라고 보고한 병사들은 전투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전투 스트레스 반응(CSR) 또는 기타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다. 부대와의 결속력이 "평균 이하"인 병사들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더 취약했다.[21]
3. 2. 신체적 증상
Combat stress reaction영어의 가장 흔한 신체적 증상은 다음과 같다.[4]이 외에도 만성 이질이나 다른 질병, 만성 피로, 무기력, 초췌함, 부주의, 무관심, 가면과 같은 얼굴 표정, 느린 말투, 빈약한 사고 내용, 기억력 결함 등이 나타날 수 있다.[11]
3. 3. 정신적 증상
Combat stress reaction영어 (전투 스트레스 반응)의 증상은 정신적 외상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하며,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장 흔한 스트레스 반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반응 시간 둔화
- 사고 둔화
- 작업 우선순위 결정의 어려움
- 일상적인 작업 시작의 어려움
- 사소한 문제 및 익숙한 작업에 대한 집착
- 우유부단함 및 집중력 부족
- 피로와 함께 나타나는 주도력 상실
- 탈진
- 불안
- 과민성
- 우울증
- 약물 남용
- 적응력 상실
- 자살 시도
- 타인에 대한 불신
- 혼란
- 통제력 상실에 대한 극심한 감정
CSR 환자가 초기에 경험하는 많은 증상은 인체의 투쟁-도피 반응의 장기적인 활성화의 영향이다. 전투 지역의 끊임없는 치명적인 위험은 병사들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준다.[17]
전투 스트레스 장애의 기본적인 증상으로는 공격 행동 충동, 알코올 의존증, 해리 증상, 불안, 무감동, 피로감, 섭식 장애, 집중력 저하, 기억 장애, 우울증, 구토, 자기 혐오, 언어 장애, 현실 도피 등이 있다.
4. 진단 및 치료
전투 스트레스 반응의 진단과 치료는 PIE 또는 BICEPS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PIE 원칙은 "아직 진단받지 않은 신경증"(NYDN) 사례에 적용되었다. 미국의 군의관 토머스 W. 샐먼은 이 PIE 원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 연합군으로부터 배우고 그 교훈을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샐먼은 전쟁이 끝날 무렵, 당시 "세계 최고의 실천"이었던 완벽한 부대 및 절차 시스템을 구축했다.[6] 그러나 PIE 접근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증거도 있다.[7]
현재 미군은 PIE 원칙 대신 BICEPS 원칙을 사용한다.
1922년 영국 정부는 ''"전쟁 쇼크"에 대한 전쟁성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방 지역: 경미한 환자는 대대나 사단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휴식과 함께 최전선 복귀를 격려하는 치료를 제공한다.
- 신경 센터: 심각한 환자는 전문가의 치료를 위해 전방에 가까운 특수 신경 센터로 보낸다. 환자에게 신경 쇠약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기지 병원: 일반 병자와 분리된 병동에서 치료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국으로 후송한다.
치료는 의사의 인격이 중요하며, 설명, 설득, 암시와 같은 간단한 정신 요법과 물리적 치료를 병행한다. 마음과 몸의 휴식이 필수적이며, 심층 최면은 일부 사례에만 유용하고, 프로이트식 정신 분석은 권장되지 않는다. 회복기에는 재교육과 적절한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
병사를 전투선으로 복귀시켜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에서 치료 후에도 유용한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영국에서 장기간의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심각한 유형의 불안 신경증인 경우
4. 정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 붕괴 또는 정신병인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복 후 보조적인 군사 임무는 가능하다.
많은 영국 참전 용사들이 연금을 받고 장기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1939년까지 약 12만 명의 영국 참전 용사가 주요 정신과적 장애로 보상을 받거나 연금을 받고 있었다.[8]
종군 기자 필립 깁스(Philip Gibbs)는 참전 용사들이 겉모습은 이전과 같아 보였지만,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 우울증, 쾌락 추구 등의 변화를 겪었다고 기록했다.
한 영국 작가는 기능적 신경 장애에 대한 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는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을 요구하는 국가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8]
4. 1. PIE 원칙
PIE 원칙은 전투 피로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다. 이 원칙은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한다.- 근접성 (Proximity): 최전선과 가까운 곳, 전투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부상자를 치료한다.
- 즉시성 (Immediacy):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 기대 (Expectancy): 모든 병사가 휴식과 보충 후 전선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다.
이러한 PIE 원칙은 "아직 진단받지 않은 신경증" (NYDN) 사례에 적용되었다. 미국의 군의관 토머스 W. 샐먼은 이 PIE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는 유럽에서 연합군의 치료 방법을 배우고 이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샐먼은 전쟁이 끝날 무렵, 당시 "세계 최고의 실천"으로 여겨지는 완벽한 부대 및 절차 시스템을 구축했다.[6]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 훈장을 받았다.[6]
하지만 PIE 접근법의 효과는 CSR 연구를 통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증거도 있다.[7]
현재 미군은 PIE 원칙 대신 BICEPS 원칙을 사용한다. BICEPS는 다음 여섯 가지를 강조한다.
- 간결성 (Brevity)
- 즉시성 (Immediacy)
- 중심성 또는 접촉 (Centrality/Contact)
- 기대 (Expectancy)
- 근접성 (Proximity)
- 단순성 (Simplicity)
1922년 영국 정부는 ''"전쟁 쇼크"에 대한 전쟁성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치료 지침을 제시했다.
- 전방 지역: 경미한 환자는 대대나 사단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휴식과 함께 최전선 복귀를 격려하는 치료를 제공한다.
- 신경 센터: 심각한 환자는 전문가의 치료를 위해 전방에 가까운 특수 신경 센터로 보낸다.
- 기지 병원: 일반 병자와 분리된 병동에서 치료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국으로 후송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설명, 설득, 암시와 같은 정신 요법과 함께 물리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마음과 몸의 휴식이 필수적이며, 심층 최면은 일부 사례에만 유용하고, 프로이트식 정신 분석은 권장되지 않았다. 회복기에는 재교육과 적절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많은 영국 참전 용사들이 연금을 받고 장기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1939년까지 약 12만 명의 영국 참전 용사가 정신과적 장애로 보상을 받았거나 연금을 받고 있었다.[8]
이스라엘은 PIE 원칙에 단순성을 추가하여, 치료가 간결하고 지지적이어야 하며,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4. 2. BICEPS 원칙
BICEPS 원칙은 전투 피로증 치료에 사용되는 여섯 가지 원칙이다.| 원칙 | 내용 |
|---|---|
| 간결성 (Brevity) | 치료는 가능한 짧게 진행한다. |
| 즉시성 (Immediacy) |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한다. |
| 중심성/접촉 (Centrality/Contact) | 환자를 전투 부대와 최대한 가깝게 유지하고, 동료들과의 접촉을 유지시킨다. |
| 기대 (Expectancy) | 환자가 곧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다. |
| 근접성 (Proximity) | 환자를 전투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한다. |
| 단순성 (Simplicity) | 복잡한 치료보다는 단순하고 실질적인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
이 원칙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 군의관 토머스 W. 샐먼(Thomas W. Salmon)이 발전시킨 PIE 원칙 (근접성, 즉시성, 기대)을 기반으로 한다.[6] 샐먼은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PIE 원칙을 체계화했다.
하지만, PIE 접근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7]
1922년 영국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전투 피로증 치료에 대한 유사한 권고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보고서는 경미한 환자는 전방에서 치료하고, 복귀를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료는 휴식과 함께 설명, 설득, 암시와 같은 정신 요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4. 3. 치료 방법
미국 군의관 토머스 W. 샐먼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 연합군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PIE 원칙을 확립했다. PIE는 근접성(Proximity), 즉각성(Immediacy), 기대(Expectancy)의 약자로, 전투 현장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치료하고, 병사들이 곧 회복하여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6] 그러나 PIE 접근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7]현대 미군은 PIE 대신 BICEPS 원칙을 사용한다. BICEPS는 간결성(Brevity), 즉각성(Immediacy), 중심성/접촉(Centrality/Contact), 기대(Expectancy), 근접성(Proximity), 단순성(Simplicity)을 의미한다.
1922년 영국 정부는 "전쟁 쇼크"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전방, 신경 센터, 기지 병원에서의 단계별 치료와 재활, 복귀 기준을 제시했다. 핵심은 휴식과 심리적 지지, 그리고 간단한 정신 요법 및 물리 치료였다. 심층 최면 요법이나 프로이트식 정신분석은 권장되지 않았다.[8]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은 초기에는 제1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잊었으나, 조지 S. 패튼 장군의 뺨 때리기 사건 이후 전방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대 응집력을 강조했다.[9] 존 애플은 미군 보병의 전투 피로도가 200~240일 만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투 기간 제한과 함께 전쟁의 의미를 강조하는 등의 사기 진작책을 제안했다.[9]
반면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PIE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영국군은 병력 부족으로 인해 부상병을 48시간만 붙잡아두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PIE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8]
캐나다군은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별도의 부상 유형으로 분류하고 치료했다.[12] 역사학자 테리 코프는 훈련이나 선발만으로는 전투 스트레스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13]
나치 독일은 전투 스트레스를 의지 부족이나 비겁함으로 간주했지만,[15]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스트레스 관련 사상자가 증가했다. 핀란드는 전투 피로를 나약함으로 간주하고 가혹하게 대처했다.
현대 군사 훈련에는 스트레스 노출 훈련(SET)이 포함된다. SET는 스트레스 환경에 대한 지식 제공, 기술 습득, 적용 및 훈련을 통한 자신감 구축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22]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펜토탈 나트륨을 이용한 마취 요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 방법은 환자가 외상 경험을 재경험하고 발산하도록 돕는 방식이었다.[28]
5. 예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병사는 단기간 내에 부대로 복귀할 수 있다. 1982년 레바논 전쟁 자료에 따르면, 전선 근처에서 치료받은 전투피로증(CSR) 부상자의 90%가 보통 72시간 안에 부대로 돌아갔다. 반면, 후방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는 40%만이 복귀했다.[5] 한국 전쟁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미군 전투 피로 부상자의 85%가 3일 안에 임무에 복귀했고, 10%는 몇 주 후에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했다.[4]
하지만, 성급하게 전투에 복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PIE나 BICEPS와 같은 치료법은 가능한 한 많은 군인을 빠르게 전투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군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서 PIE 원칙이 널리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PTSD 평생 유병률은 1989년 미국 연구에서 30%, 1996년 호주 연구에서 21%로 나타났다.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참전 용사 연구에서는 전투 중 CSR 진단을 받은 군인의 37%가 나중에 PTSD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CSR 진단을 받지 않은 군인(14%)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29]
6. 논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전투 스트레스 반응(CSR) 치료 원칙인 PIE와 BICEPS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겪는 군인을 다시 전투에 투입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의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30] PIE 및 BICEPS 원칙 지지자들은 이러한 원칙이 장기적인 장애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투 스트레스 반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30]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여 전투 스트레스 반응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일부 군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약물이 참전 용사들의 장기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 치료가 이미 높은 수준인 전투 스트레스 반응 환자들의 약물 남용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30]
최근 연구에서는 폭발 외상이 심리적인 원인보다는 신경 뇌 손상과 같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1] 외상성 뇌 손상과 전투 스트레스 반응은 서로 다른 원인을 가지지만 유사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더 나은 진단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31]
7. 한국군의 전투 스트레스 관리
한국군은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다양한 전쟁 경험을 통해 전투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현재는 국방부, 각 군 본부, 사단급 이상 부대에 정신건강 증진 전담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7. 1. 기타 프로그램
전투 스트레스 반응(CSR)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성격 특성을 가진 병사를 미리 선별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CSR 이환율을 한두 가지 성격 특성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실패 원인 중 하나이다. 전체적인 심리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필기 검사는 비효율적이고 쉽게 위조될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실시된 선별 프로그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사 훈련 중 나타나는 정신 질환이 전투 중의 스트레스 장애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20]8. 각국의 전투 스트레스 반응 연구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군의관들은 참호에 대한 포격 중 발생하는 폭음이 병사들의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았고, 이를 셸 쇼크(shell shock영어, 포탄 쇼크 또는 전장 쇼크)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 포격과 관계없이 장기간의 전투로도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쟁 신경증 (war neurosis영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러한 병사들의 관찰을 바탕으로 반복적이고 강박적인 외상성 악몽에 대해 연구했다.
제2차 세계 대전에는 전투 피로 (combat fatigue영어)라고도 불렸으며, 전투 기간이 길어지면 성격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병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에서는 이 시기에 전투 스트레스 증상을 '전쟁 신경증'으로 번역했다. 1938년 육군성 의사과장은 귀족원에서 "구미 군대에는 전쟁 신경증 환자가 많지만, 황군에는 한 명도 없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고후다이 병원 등에서 많은 병사들이 치료를 받았다.[35][36]
한국 전쟁에서는 전투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하고, 정신병적 손해 (psychiatric casualities영어)라는 명칭으로 관련 증상을 보이는 병사를 평가했다. 그러나 연구 초점은 전투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전적인 전투 스트레스 반응에서 새로운 후유증으로 옮겨갔다.
1980년대 베트남 전쟁 참전 베트남 귀환 병사들이 사회 복귀 후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는 현상이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명명되었다.
8. 1. 미국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미국 군대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치료 교훈을 대부분 잊고 있었다. 지원자 선별은 처음에는 엄격했지만, 경험상 예측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결국 드러났다.미국은 1941년 12월에 전쟁에 참전했다. 각 사단 조직표에 정신과 의사가 추가된 것은 1943년 11월이었으며, 이 정책은 지중해 전역에서는 1944년 3월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1943년까지 미 육군은 정신과 사례에 대한 초기 진단으로 "피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군 정신의학의 일반적인 원칙이 사용되고 있었다. 조지 패튼(George Patton) 조지 S. 패튼 뺨 때리기 사건은 부분적으로 1943년 9월 이탈리아 침공에 대한 전방 치료를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대 응집력과 집단 소속이 보호 요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존 애플은 이탈리아 주둔 미군 보병의 평균적인 피로도가 200~240일 만에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미국 군인은 "전우를 위해 싸우거나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몇 달간의 전투 이후, 군인은 전투에서 용기를 증명했고 함께 훈련받았던 대부분의 전우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계속할 이유가 부족했다. 애플은 군인들의 현역 전투 기간을 180일로 제한하는 것을 시행하도록 도왔고,[9] 전쟁의 의미를 더 강조하여, 적들이 미국을 정복하려는 계획을 강조하고, 다른 국가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의 가족에게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며 싸우도록 격려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정신과 의사들은 집에서 온 편지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군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불필요하게 언급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믿었다. 윌리엄 메닝거(William Menninger)는 전쟁 후 "군인에게 편지 쓰기 교육 과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명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에드워드 스트레커(Edward Strecker)는 아들들을 "젖 떼는 데" 실패한 후 편지를 통해 사기를 훼손하는 "엄마들" (친모와 반대되는 의미)을 비판했다.[10]
비행사들은 유럽보다 남서 태평양에서 훨씬 더 자주 비행했고, 호주에서 휴식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유럽에서와 같이 전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정된 임무 수는 없었다. 단조롭고 덥고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과 결합되어, 이는 베테랑들이 신참들에게 빠르게 전파하는 좋지 않은 사기를 초래했다. 몇 달 후, 전투 피로의 유행은 부대의 효율성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항공 외과 의사들은 정글 비행장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 이질이나 다른 질병을 앓고 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만성 피로 상태를 보인다. ... 그들은 무기력하고, 초췌하며,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며, 얼굴 표정은 거의 가면과 같다. 말은 느리고, 사고 내용은 빈약하며, 만성 두통, 불면증, 기억력 결함을 호소하고, 잊혀졌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해 걱정하고, 새로운 임무를 두려워하며, 책임감이 없고, 미래에 대해 절망한다.[11]
제2차 세계 대전 연구에서 소속 부대에 대한 동지애와 자부심이 "평균 이상"이라고 보고한 병사들은 전투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며, 전투 스트레스 반응(CSR) 또는 기타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았다. 부대와의 결속력이 "평균 이하"인 병사들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더 취약했다.[21]
1980년대에 걸쳐 베트남 전쟁 참전 베트남 귀환 병사가 사회 복귀 후에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보이는 것이 미국 정신 의학회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명명되었다.
8. 2. 영국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은 셸 쇼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22년 영국 정부는 '전쟁 쇼크'에 대한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발간하여 전방, 신경 센터, 기지 병원에서의 치료 지침과 치료 형태, 전투 복귀 조건 등을 제시했다.[8] 이 보고서는 경미한 환자는 최전선에서 치료하고, 심각한 환자는 신경 질환 전문가에게 의뢰하며, 회복기에는 재교육과 적절한 직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프로이트식 정신분석은 권장하지 않았다.그러나 많은 영국 참전 용사들이 정신적 장애로 연금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8] 종군 기자 필립 깁스는 참전 용사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고통을 묘사했다.[8] 한 영국 작가는 기능적 신경 장애에 대한 보상이 부적절하며, 이는 참전 용사들의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영국은 제1차 세계 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PIE 원칙을 활용하여 전투 스트레스 반응에 대응했다. 그러나 영국 해협을 건너 부상병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PIE 원칙의 기대 원칙(모든 사람이 휴식과 보충 후 전선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8] 영국군은 미국군보다 더 오랫동안 전투를 지속할 수 있었는데, 이는 더 나은 순환 일정과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8]
영국은 PIE 원칙을 발전시켜 전투 스트레스 반응(CSR) 치료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8. 3. 독일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병사의 전투 스트레스 반응을 연구한 군의관들은 폭음을 동반하는 참호에 대한 포격으로 인해 이러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증상을 셸 쇼크(shell shock영어)(포탄 쇼크, 전장 쇼크라고도 함)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후 포격과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친 전투로도 반응이 나타나면서 전쟁 신경증 (war neurosis영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제2차 세계 대전에는 전투 피로(combat fatigue영어)라고도 불렸으며, 전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성격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병사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버트 G. L. 웨이트의 저서 《나치즘의 선구자》에서 나치 이전의 자유군단 준군사 조직의 역사를 다루면서, 역사학자 웨이트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독일 군인들에게 미친 몇 가지 정서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헤르만 괴링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언급된 "비잔혹해질"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구절을 언급했다.[14]
루돌프 브리켄슈타인 박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면서 1935년 입원 환자의 1%에서 1942년 6%로 스트레스 관련 사상자가 급증했다. 또 다른 독일 정신과 의사는 전쟁 후, 엔젠에서 마지막 2년 동안 입원 환자의 약 3분의 1이 전쟁 신경증 때문이었다고 보고했다. 실제 문제의 심각성은 덜했고, 문제에 대한 인식도 덜했을 가능성이 크다.[15]
8. 4. 핀란드
겨울 전쟁 당시 카렐리안 지협 전선의 여러 핀란드 기관총 사수들은 요새화된 핀란드 진지에 대한 소련군의 인해전술 공격을 여러 차례 격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 핀란드군의 "전투 피로"에 대한 태도는 가혹했다. 군의관장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해리 페더리는 쉘 쇼크를 나약한 성격과 도덕성 결여로 간주하고, 환자들이 최전선으로 복귀할 때까지 괴롭힘과 학대를 가하는 방식으로 치료했다.8. 5.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서는 전투 스트레스에 의한 증상을 '전쟁 신경증'으로 불렀다. 1938년 육군성 의사과장은 귀족원에서 "황군에는 전쟁 신경증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고후다이 병원 등에서 많은 병사들이 치료를 받았다.[35][36]참조
[1]
서적
Field Manual No. 6-22.5. Combat and Operational Stress Control Manual for Leaders and Soldi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9-03-18
[2]
웹사이트
World War I - Killed, wounded, and missing
https://www.britanni[...]
2021-09-28
[3]
웹사이트
WWII Post Traumatic Stress
https://www.national[...]
2020-06-27
[4]
웹사이트
"Combat Stress Control in a Theater of Operations'' US Army Publication"
http://www.vnh.org/F[...]
2004-09-26
[5]
서적
Military Psychiatry
Gabriel, R.A.
1986
[6]
간행물
Thomas W. Salmon: Advocate of Mental Hygiene
http://www.ajph.org/[...]
Ajph.org
2012-10-23
[7]
웹사이트
Treating Survivors in the Acute Aftermath of Traumatic Events
http://www.ncptsd.v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2012-10-23
[8]
서적
A War of Nerves: Soldiers and Psychiatrists, 1914–1994
Jonathan Cape
2000
[9]
뉴스
Psychiatrist, 89, Is No Couch Potato John Appel Is Still Practicing And Still Writing Books. He Describes His Latest As A 'How-to ... For Staying Sane.'
http://articles.phil[...]
2000-07-13
[10]
서적
Miss Yourlovin: GIs, Gender, and Domesticity during World War II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09-21
[11]
서적
Medical support of the Army Air Forces in World War II
1955
[12]
서적
Battle Exhaustion. Soldiers and Psychiatrists in the Canadian Army, 1939–1945
[13]
서적
The Brigade
Stackpole Books
2007
[14]
서적
Vanguard of Nazism: the Free Corps Movement in Post-war Germany, 1918–1923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15]
서적
Contemporary Studies in Combat Psychiatry
1987
[16]
문서
Psychological Support to ADF Operations: A Decade of Transformation
[17]
서적
Psychology
"[[W. W. Norton & Company]]"
[18]
간행물
Stress and the General Adaptation Syndrome
[19]
서적
What's the Good of Counselling & Psychotherapy?
https://books.google[...]
Sage
2019-08-12
[20]
간행물
Psycho-neurotics in Combat
[21]
간행물
Fear God and Dreadnought: Preparing a Unit for Confronting Fear
1995-07
[22]
서적
Making decisions under stress: Implications for individual and team training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8
[23]
간행물
Effects of Preparatory Information on Enhancing Performance Under Stress
[24]
간행물
Test Anxiety and Direction of Attention
[25]
간행물
In Vivo Distraction – Coping in the Treatment of Test Anxiety
[26]
간행물
The Impact of Stress Experience on Heart Rate and Task Performance in the Presence of a Novel Stressor
[27]
간행물
Does Stress Training Generalize to Novel Settings?
[28]
웹사이트
The Tunisian Campaign, War Neuroses, and the Reorientation of American Psychiatry During World War II
https://www.research[...]
2024-03-30
[29]
간행물
Frontline treatment of combat stress reaction: a 20-year longitudinal evaluation study
2005-12
[30]
간행물
Psychiatric medications for deployment: an update
Military Medicine [serial online]. July 2007; 172(7):681–685. Available from: MEDLINE with Full Text, Ipswich, MA
[31]
간행물
Shell Shock Revisited: Solving the Puzzle of Blast Trauma
[32]
웹사이트
戦争神経症とは
https://kotobank.jp/[...]
2022-08-03
[33]
웹사이트
名前。生年。死亡年。「Find a Grave」 メモリアル
https://ja.findagrav[...]
2024-08-19
[34]
웹사이트
National Archives NextGen Catalog
https://catalog.arch[...]
2024-05-21
[35]
웹사이트
"「皇軍には戦争神経症がいない」...大ウソでした"
https://books.j-cast[...]
BOOKウォッチ
2024-06-27
[36]
웹사이트
戦後70年以上PTSDで入院してきた日本兵たちを知っていますか 彼らが見た悲惨な戦場
https://www.buzzfeed[...]
Bazzfeed Japan
2016-12-0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