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작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남작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시대에 걸쳐 존재했던 귀족 작위로, 봉건 영주 중 낮은 지위에 해당한다. 동양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남작에 해당하는 작위가 있었으며, 서양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남작이 귀족 작위 중 가장 낮은 등급이며, 1387년 리처드 2세에 의해 공식 칭호로 도입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남작 칭호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적 지위나 예우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남작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노르만 왕조는 프랑스식 봉건제를 잉글랜드 왕국에 도입했다. 초기에 '남작'은 특정 칭호나 계급이라기보다는 '왕의 남작'(barones regis|바로네스 레기스lat)처럼 왕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했다. 이전 앵글로-색슨 왕국에서는 왕의 측근이 백작 칭호를, 스코틀랜드에서는 테인 칭호를 가졌다. 왕에게 직접 영지를 받아 봉사하는 수장 영주들은 모두 '왕의 남작'으로 불렸으며,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고 왕의 의회에 참석해야 했다.[5]
2. 역사


처음에는 왕에게 직접 군사적 봉사를 통해 토지를 받은 모든 이들(백작 포함)이 남작으로 불렸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 시기에는 기사단 복무를 통해 남작령(per baroniam|페르 바로니암lat)을 보유한 더 큰 남작과 장원만 보유한 더 작은 남작이 구분되기 시작했다.[7] 노르만 정복 후 약 1세기 뒤인 1164년 토마스 베켓의 사례처럼, 영향력 있는 남작들에게 개인적인 소환장을 보내 국왕 의회(이후 의회, 나중에는 상원으로 발전)에 참석하도록 하는 관행이 생겨났다. 반면,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 따라 각 군의 작은 남작들은 치안관을 통해 집단 소환장을 받았고, 이들 중 대표자(샤이어 기사로 발전, 하원의 전신)만 선출되어 참석했다.[8] 이로써 큰 남작과 작은 남작 간의 구분이 명확해졌다.[8]
이후 국왕은 소환장 발부나 특허장 수여를 통해 새로운 남작위를 만들기 시작했다.[8] 중세에는 소환장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대에는 특허장에 의한 창설이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8] 소환장 방식이 도입되면서 남작위는 토지 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졌고, 봉건 남작위는 1660년 토지 소유 폐지법 등으로 법적 효력을 잃었다.[9]
2. 1. 동양
동양권, 특히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서양의 '남작'에 비견될 수 있는 작위가 존재했다. 이는 대체로 고대 중국의 오등작(공, 후, 백, 자, 남) 체계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하거나 변형되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시대에 오등작의 최하위 작위로 등장하여 이후 왕조 교체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신해혁명으로 폐지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에 잠시 시행되었으나 원 간섭기에 폐지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제도를 따라 조선귀족의 하나로 수여되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화족 제도의 다섯 등급 중 최하위 작위로 설정되어 1947년까지 유지되었다.
아래는 주요 동양 국가 및 지역에서 남작에 해당하는 작위 명칭이다.
| 국가 또는 지역 | 남작에 해당 |
|---|---|
| 중국 | 男爵|난주에중국어 |
| 일본 | 男爵|단샤쿠일본어 (히라가나: だんしゃく) |
| 한국 | 남작 (男爵) |
| 만주 | 아샨-이 하판 (ashan-i hafan) |
| 베트남 | nam tước|남 뜨억vi (Chữ Hán: 男爵) |
각 국가별 남작 제도의 구체적인 역사와 특징은 해당 하위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1. 1. 한국
고려 시대 문종 때에는 종5품 현남(縣男)이 남작에 해당했으며, '''개국남'''(開國男)이라고도 불렸다. 이는 정5품 개국자(開國子) 바로 아래 서열의 작위였다. 남작으로 봉작된 인물로는 제양현개국남(濟陽縣開國男) 채충순, 해남현개국남(海南縣開國男) 주저 등이 있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접어들면서, 제후국에 작위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원나라의 압력으로 충렬왕 때 폐지되었다. 이후 원나라의 세력이 약해진 공민왕 대에 자주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잠시 부활하기도 했으나, 곧 사라졌다.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전례를 따라 개국공신들의 본관에 따라 작위를 수여하기도 했으나, 태종 즉위 후인 1401년, 명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작위와 함께 폐지하였다. 이후 대한제국 시기인 1898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칭제건원을 했음에도 작위 제도를 부활시키지 않고 기존의 봉군제를 유지했다.
경술국치 이후 일제는 한일 병합에 협력했다는 명분으로 구 대한제국의 방계 황족과 관리 76명에게 조선귀족 작위를 수여했는데, 이 중 남작위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이었다. 이항구와 같이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이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0년 조선귀족령에 따라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일본 화족 제도에 준했지만, 귀족원 의원이 될 특권은 없었다는 차이가 있었다. 작위 수여는 주로 양반 출신들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일제가 주는 작위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남작 수여 대상자 45명 중 9명(20%)은 이를 거부하거나 반납하며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제2차 한일 협약 체결에 분노하여 을사오적 처형을 주장했고, 남작 서작을 치욕으로 여겨 자결한 김석진, 남작위를 반납하고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가진, 을사조약 체결에 저항하다 면직되었고 작위 수여를 거부한 뒤 조선교육회 창설에 참여한 한규설 등이 있다. 이들은 일제의 회유를 거부하고 항거한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2. 1. 2. 중국
유교 경전에서는 남작이 다른 오등작과 함께 고대 중국의 하나라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상나라 때에는 자작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은주혁명 이후 주나라가 패권을 잡으면서 자작과 함께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은 후대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어, 실제로는 주나라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주나라 시대에 남작은 오등작 중 가장 낮은 지위였으며, 자작과 함께 50리(약 20km)의 영토와 1군(軍)의 병력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남작에 봉해진 제후로는 허나라의 군주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후 진나라에서는 상앙의 변법으로 인해 오등작 제도가 폐지되면서 남작위도 사라졌다.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위진남북조 시대에 '개국남(開國男)'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했으며, 당시 행정 구역 명칭에 따라 '현남(縣男)'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작위는 이후 청나라 시대까지 이어지다가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왕조와 함께 제정이 무너지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2. 1. 3.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황족과 사족 사이에 화족 계급이 성립되면서 화족 신분 중 마지막인 제5등위 계급으로 남작위가 만들어졌다. 1869년 6월 17일 행정관 543호에 따라 공가와 무가의 최상층인 다이묘가를 통합하여 화족 신분이 탄생했지만, 처음에는 화족 내 서열 제도가 없었다. 여러 등급안이 논의된 끝에, 1878년 법제국 대서기관 오자키 미쓰라와 소서기관 사쿠라이 요시미(桜井能監)가 제안한 고대 중국의 오등작(공, 후, 백, 자, 남) 제도가 채택되었다.1884년 7월 7일 화족령이 발효되면서 오작제에 기반한 화족 제도가 공식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경 상훈국 총재 야나기하라 마에미쓰 등이 마련한 서작 내규에 따라 남작의 서작 기준이 정해졌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메이지 유신 후 화족 2열 자 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
- 류큐 왕가의 방계 왕족
- 주요 신사(神社)의 신직(神職)을 세습해 온 14가문
- 정토진종계 세습 주지 4가문
- 남조 조정 충신의 후손
- 기타 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
- 세력이 가장 약했던 다이묘 가문
남작가의 수는 시대에 따라 변동했다. 아래 표는 남작가의 수 변화를 보여준다.
| 연도 | 남작가 수 | 전체 화족가 수 | 비고 |
|---|---|---|---|
| 1884년 | 74가 | 509가 | 화족 제도 발족 당시 |
| 1896년 | 194가 | 689가 | 청일 전쟁 후 군인 서작 급증 |
| 1902년 | 290가 | 789가 | 관료, 재계인 등 비군인 남작 증가 |
| 1907년 | 376가 | 903가 | 러일 전쟁 후 군인 서작 재급증, 자작가와 동수 |
| 1912년 | - | - | 남작가가 최다 작위가 됨 |
| 1920년 | 409가 | 947가 | 남작가 수 정점 |
| 1947년 | 378가 | 889가 | 화족 제도 폐지 직전 |
1886년 제정된 화족 세습 재산법에 의해 화족은 압류가 불가능한 세습 재산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1909년 기준으로 세습 재산을 설정한 남작가는 7%에 불과했다. 1912년에는 구 당상 화족 보호 자금령과 남작 화족 혜휼 자금 은사 내칙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작가(주로 나라 화족)에게 연간 300엔의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작위 세습(습작)은 원칙적으로 남성만이 가능했다. 1907년 화족령 개정으로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궁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습작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국 중심의 미군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일본국 헌법 제14조의 만민평등 원칙에 따라 화족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남작위를 포함한 모든 화족 작위는 사라졌다.
2. 2. 서양
서양의 남작은 영주 중에 가장 세력이 적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원래는 국왕에게 직접 영지를 하사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봉건화가 진행되는 후기에는 보통 휘하에 소영주를 거느리지 못한 채 몇 개의 장원 정도를 가지고 직접 영지를 통치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 사실상 기사와 함께 소영주로 분류된다. 다만 남작 중에도 '대남작'이라 하여 백작을 능가하는 세력을 지닌 이가 존재하기도 했다. 각 국가별 남작의 역사와 특징은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2. 2. 1. 어원
서양의 '남작'을 의미하는 단어 ''baron''은 고대 프랑스어 baronfro에서 유래했다. 이는 후기 라틴어 barōlat("사람; 하인, 군인, 용병"을 의미)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후기 라틴어 'barō'는 살리카법에서 사용되었고, 알레만 법에서는 같은 의미로 baruslat가 쓰였다.이 단어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7세기 학자 세비야의 이시도르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 βᾰρῠ́ςgrc("무거운")에서 유래했다고 보았다. 용병이 하는 "힘든 일"과 연관 지은 생각이었지만, 현재는 가능성이 낮은 설로 여겨진다.
가장 유력한 설은 이 단어가 고대 프랑크어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사, 귀족"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 beornang과 동족어로 추정된다.
한편, 1세기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코르누투스는 갈리아어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단어 baroneslat를 언급하며 이를 servos militumlat(군인의 하인)으로 해석하고 "어리석은"이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했다. 이는 고전 라틴어에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bārōlat가 있었기 때문이다.[2] 초기 기록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켈트어파 언어의 *barcel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를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3]
2. 2. 2. 영국

영어로 남작은 바론(baron), 여성형은 배로니스(baroness)라고 한다. 영국에서 배로니스는 남작의 아내(남작 부인)나 작위를 가진 여성(여남작) 모두에게 사용된다.
=== 잉글랜드 및 연합 왕국 ===
11세기에서 12세기 초 잉글랜드에서는 국왕에게 직접 봉토를 받은 모든 영주, 즉 봉토 직수령자(tenant-in-chief)를 '배런(baron)'이라고 불렀다.[4] 이들의 봉토 상속세는 보통 영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중세 라틴어 단어 ''barō''는 초기 노르만 잉글랜드의 영주로서 "남작령"(라틴어 ''per barōniam'') 토지를 소유하고, 13세기까지 잉글랜드 의회로 발전한 대의회(Magnum Concilium)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했다.[4]
1200년경부터 배런은 하나의 계급으로 자리 잡았고, '상위' 또는 '하위' 귀족 등으로 지위가 나뉘기도 했다. 초기에는 영지를 가진 사람이 배런이 될 수 있었으나, 에드워드 1세 시대부터는 국왕에게서 의회 소환장(writ of summons)을 받은 사람만이 배런 자격으로 궁정 회의(훗날 상원으로 발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배런의 지위는 영지 소유 여부가 아니라 국왕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소집장을 받은 이들에게 특정 칭호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남작(Baron) 칭호는 1387년 리처드 2세가 칙허(letters patent)를 통해 존 드 보챔프(John de Beauchamp)에게 키더민스터 남작(Baron of Kidderminster) 작위를 수여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러한 칙허장에 의한 작위 수여는 헨리 6세 시대에 일반화되었다. 이로써 남작은 소유지 보유 유무와 관계없이 칙허장으로 주어지는 최하위 귀족 칭호로 변화했다.
잉글랜드 귀족 작위, 그레이트브리튼 귀족 작위, 아일랜드 귀족 작위, 연합 왕국 귀족 작위에서 남작은 가장 낮은 등급이며, 자작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단, 스코틀랜드 귀족 작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봉건 남작령은 현재 법적 효력이 없지만, 역사적 칭호는 현존하는 귀족 작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58년 일대귀족법이 제정되면서 세습되지 않는 일대귀족(Life peerage) 작위가 도입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남작위를 받는다.
==== 호칭 ====
영국에서 남작은 일반적으로 'Baron [남작위]'보다는 'Lord [남작위]'(경)라고 불린다. 이는 'baron'이 원래 직속 수봉자를 의미했던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여기서 '[남작위]'는 개인의 성이 아닌 작위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애시버튼 남작의 현 당주는 마크 베어링이지만, '애시버튼 경(Lord Ashburton)'으로 불린다. 물론 로스차일드 남작처럼 작위명과 성이 같은 경우도 있다.
- 정식 호칭:
- 남작: 'The Right Honourable The Lord [남작위]'[8][11][12]
- 남작 부인: 'The Right Honourable The Lady [남작위]'[8][11][12]
- 여남작 (고유 자격): 'The Right Honourable The Baroness [남작위]' 또는 'The Right Honourable The Lady [남작위]' (개인 선호에 따라 다름. 예: 대처 여사, 워시 남작부인)[12][13][14]
- 비공식 호칭:
- 남작: 'Lord [남작위]'
- 남작 부인: 'Lady [남작위]'
- 여남작: 'Baroness [X]' 또는 'Lady [X]'
- 직접 호칭: 'My Lord', 'Your Lordship', 'My Lady', 'Your Ladyship'
- 자녀: 'The Honourable [이름] [성]'. 부모 사망 후에도 이 호칭을 유지한다.
- 예우 남작: 'Lord [남작위]'. 부인은 'Lady [남작위]'. (The, Right Honourable 생략)
여남작의 남편은 부인으로부터 어떠한 칭호도 받지 않는다.
'The Right Honourable'은 'The Rt Hon.' 또는 'Rt Hon.'으로 축약된다. 군주가 공문서에서 언급할 때는 'Our right trusty and well-beloved'로 변경되며, 추밀원 의원일 경우 'Counsellor'가 추가된다.
영국 여권에는 귀족 칭호를 기재할 수 있다. 성(姓) 필드에 'Lord [남작위]', 'Baroness [남작위]', 'Lady [남작위]' 등을 입력하고, 관찰 사항에는 '소지자는 The Right Honourable [이름] [성] Lord [남작위]'와 같이 전체 이름과 칭호를 기록한다.[20][21]
=== 스코틀랜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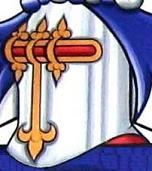
스코틀랜드의 남작(스코틀랜드 남작)은 잉글랜드의 남작과 다르다. 이는 고대 스코틀랜드 귀족 계급으로, 과거 왕실 헌장에 의해 자유 남작령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한 봉건 영주(feudal baron)를 의미한다.[26] 리옹 법원(Lord Lyon King of Arms)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남작(및 더 높은 칭호의 남작령 소유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지위에 맞는 문장과 헬멧을 수여한다.
스코틀랜드 남작은 의회 영주(Lord of Parliament)보다 낮은 지위이며, 귀족(noble)이지만 귀족 작위(peerage)를 가진 것은 아닌 소 남작(minor baron)으로 분류된다. 이 지위는 상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남작에 해당하는 칭호는 의회 영주이다. 제임스 1세 치세인 1428년경부터 소 남작은 스코틀랜드 의회에 소환되지 않았고, 부유한 남작들이 의회 영주로 임명되어 의석을 가지게 되었다.[27]
==== 호칭 ====
스코틀랜드 남작은 자신의 성 뒤에 영지(남작령) 이름을 붙여 칭한다. 예를 들어 '존 스미스 오브 에든버러, 에든버러 남작'(John Smith of Edinburgh, Baron of Edinburgh) 또는 '존 스미스, 에든버러 남작'(John Smith, Baron of Edinburgh)과 같이 쓴다.[17][18][19] 가장 격식 있는 서면 표기는 'The Much Honoured Baron of Edinburgh'이다.
- 남작 부인: 'Lady Edinburgh' 또는 'The Baroness of Edinburgh'. 부인이 직접 남작령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Lady of Edinburgh'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 구두 호칭: 남작령 이름('에든버러') 또는 단순히 '남작(Baron)'으로 불릴 수 있다.
- 비공식 (제3자 지칭): '남작 오브 [X]' 또는 '[X]'.
스코틀랜드 남작은 여권의 성명란에 '[성] 오브 [영토 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관찰 사항에는 '소지자는 [이름] [성] 에든버러 남작'과 같이 기록된다. 이를 위해서는 리옹 법원의 인정 증거나 버크 귀족 명감(Burke's Peerage) 등재가 필요하다.[20][21]
=== 준남작 ===
귀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남작보다 한 단계 낮은 세습 칭호로 준남작(Baronet)이 있다.
2. 2. 3. 프랑스
12세기 프랑스에서 '바롱'(baron프랑스어)은 특정 지역의 중요한 봉토를 소유한 모든 영주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13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국왕에게 직접 봉토를 받은 실력자들을 뜻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는 중간 정도의 지위를 가진 봉신이었던 백작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했다.하지만 14세기 초부터 남작 칭호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남작들은 여전히 다른 백작들보다 더 많은 권세와 영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지위는 백작과 자작 아래로 여겨지게 되었다. 17세기까지 남작 칭호를 가지려면 남작령을 소유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절대왕정 하에서 루이 14세는 수많은 국왕 칙허장을 통해 많은 남작을 임명하였고, 이로 인해 남작 칭호의 가치가 처음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남작위 수여는 그 뒤 나폴레옹 황제가 다시 시작했으며 루이 18세, 샤를 10세, 루이 필리프 통치기까지 이어졌다. 잠시 중단되었다가 나폴레옹 3세 시대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작위가 수여되었다. 1870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남작 칭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역대 공화정부들은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실제로는 남작 작위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남작으로 칭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 2. 4. 독일
독일에서는 남작을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로운 영주'를 뜻하는 말인 Freiherr|프라이헤어deu라고 불렀다. 원래 이 말에는 왕가 사람들과 같은 지위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백작(Graf) 칭호를 갖지 않았으면서도 백작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들 가운데 세력이 강한 자들이 스스로 백작을 칭하게 되면서 프라이헤어 칭호는 그보다 낮은 귀족 작위가 되었다. 황제칙허장을 내려 프라이헤어의 칭호를 수여하는 관행은 16세기 황제 카를 5세 때 생겼고, 이후 독일의 모든 군주들이 이를 따르게 되었다.2. 2. 5. 이탈리아
중세 이탈리아의 남작들은 자신의 영지 안에서 막강한 재판권을 행사했고 때로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었다. 물론 항소권도 있기는 했으나 실효성이 거의 없었으며, 시칠리아나 사르데냐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 남작의 권력은 특히 남부 지방에서 더욱 강해져, 화폐를 주조하고 개인적인 전쟁을 벌일 권한까지 갖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남작 칭호는 1945년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2. 2. 6. 스페인
중세 초기 나바라와 아라곤에서는 고위 귀족을 Barón|바론es이라 불렀으며, 나중에는 카스티야의 영향을 받아 Ricos hombres|리코스 옴브레스es('부유한 사람들'이라는 뜻)라고도 칭했다.[26]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본래 지역 실력자를 의미했으나, 중세 말기에는 프랑스의 남작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26] 일부 귀족들은 이 칭호를 계속 보유하려 했으나, 1812년 카디스에서 열린 코르테스(스페인 의회)에서 남작위는 폐지되었다.[26]스페인의 귀족 계급에서 남작 작위는 Vizconde|비스콘데es(자작) 다음이며, Señor|세뇨르es(영주)보다는 상위에 위치한다.[28] 여성 남작이나 남작 부인은 Baronesa|바로네사es라고 부른다.[28]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남작 작위는 대부분 아라곤 왕관에서 유래했다.[28]
남작들은 19세기 중반에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잃었으며, 이후 남작 작위는 순전히 명예적인 칭호가 되었다.[28] 대부분의 남작은 Grandeza|그란데사es 지위를 가지지 못했지만, 작위가 그란데사와 함께 수여되는 경우도 있었다.[28] 국왕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남작 작위를 수여하고 있다.[28]
3. 현대 사회에서의 남작
(내용 없음)
3. 1. 영국
정식으로 남작은 'The Right Honourable The Lord [남작위]'로 불리며, 남작의 부인은 'The Right Honourable The Lady [남작위]'로 불린다.[8][11][12] 이 공식 칭호에서 'The Right Honourable'은 종종 'The Rt Hon.' 또는 'Rt Hon.'으로 축약된다. 군주가 공문서에서 남작을 언급할 때는 'The Right Honourable' 대신 'Our right trusty and well-beloved'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남작이 추밀원 의원일 경우에는 'Counsellor'라는 칭호가 추가된다.자신의 권리로 작위를 받은 여성 남작(Baroness in her own right)은 세습 또는 종신 남작위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The Right Honourable The Baroness [남작위]' 또는 'The Right Honourable The Lady [남작위]'로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마거릿 대처와 사이다 워시는 모두 자신의 권리로 종신 남작 작위를 받았지만, 각각 'Lady Thatcher'와 'Baroness Warsi'라는 다른 호칭을 사용했다.[12][13][14]
비공식적인 자리나 호칭에서는 남작을 'Lord [남작위]'로, 그의 부인을 'Lady [남작위]'로 부른다. 자신의 권리로 작위를 받은 여성 남작은 'Baroness [남작위]' 또는 'Lady [남작위]'로 칭한다. 직접 대화할 때는 남작에게 'My Lord' 또는 'Your Lordship'으로, 남작부인이나 여성 남작에게는 'My Lady' 또는 'Your Ladyship'으로 부를 수 있다. 자신의 권리로 작위를 받은 여성 남작의 남편은 부인의 작위로부터 어떠한 칭호나 호칭 방식도 얻지 못한다.
세습 또는 종신 남작과 여성 남작의 자녀는 'The Honourable [이름] [성]'이라는 호칭 방식을 사용하며, 이 호칭은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예우상 남작(courtesy baron, 상위 귀족의 장남 등이 예우로 받는 남작 칭호)은 'Lord [남작위]'로 불리며, 그의 부인은 'Lady [남작위]'로 불린다. 이때는 공식 칭호에 붙는 정관사 'The'가 항상 생략되며, 예우상 남작이 추밀원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The Right Honourable' 호칭 방식도 사용하지 않는다.
남작이나 여성 남작의 성(姓)이 작위의 공식 명칭과 같거나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귀족으로 불릴 때는 'Lord', 'Lady', 또는 'Baroness'라는 칭호 뒤에 개인 이름이 아닌 작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작위의 명칭이 개인 성과 완전히 다르거나(윌리엄 톰슨, 켈빈 경) 성 외에 영토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마틴 리스, 루들로 경)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남작이나 여성 남작의 이름을 칭호 앞에 붙여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마거릿 대처를 "대처 여사(Dame Margaret Thatcher)"가 아닌 "대처 남작부인(Baroness Thatcher)" 또는 "대처 여남작(Lady Thatcher)"으로 불러야 하며, 이름을 포함하여 "마거릿 대처 여사" 등으로 부르는 것은 백작, 후작, 공작의 딸이거나 가터 기사 또는 엉겅퀴 기사 작위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 디그비 존스를 "디그비 존스 경(Sir Digby Jones)"이 아닌 "버밍엄의 존스 경(Lord Jones of Birmingham)"으로 불러야 하며, "디그비 존스 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남작이 아닌 준남작(Baronet)이거나 기사 작위(Knighthood) 수여자임을 의미할 수 있다. (원본 소스의 예시 설명이 다소 혼란스러워 한국어 위키백과의 일반적인 이해에 맞춰 수정함)
영국은 여권에 귀족 칭호를 기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칭호는 성(姓) 필드에 입력되며, 소지자의 전체 이름과 칭호를 명시하는 비고(observation)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남작은 성 필드에 'Lord [남작위]'라고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소지자는 The Right Honourable [이름] [성] Lord [남작위]임'(The holder is The Right Honourable [Given Name] [Surname] Lord [Title])이라고 적힌다. 만약 귀족 칭호가 성과 다른 경우, 신청자는 성 필드에 자신의 성 또는 칭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권리로 작위를 받은 여성 남작은 "Lord" 대신 "Baroness"를 사용하고, 남작의 부인은 "Lady"를 사용한다. 귀족 칭호는 여권 신청 시 Debrett's Peerage, Who's Who, 또는 London Gazette와 같은 공식 명부를 통해 확인된다.
스코틀랜드 남작(Scottish baron)은 영국의 귀족 남작(peerage baron)과는 다른, 봉건적 기원을 가진 칭호이다. 스코틀랜드 남작은 해당 영지를 소유한 경우, 씨족장(clan chief)과 유사하게 자신의 성 뒤에 영지 이름을 붙여 '존 스미스 오브 에든버러'(John Smith of Edinburgh) 또는 '존 스미스, 에든버러 남작'(John Smith, Baron of Edinburgh)과 같이 표기한다.[17][18][19] 가장 격식을 갖춘 서면 표기는 '존경하는 에든버러 남작'(The Much Honoured Baron of Edinburgh)이다. 그의 부인은 '레이디 에든버러'(Lady Edinburgh) 또는 '에든버러 남작 부인'(The Baroness of Edinburgh)으로 칭한다. '레이디 오브 에든버러'(Lady of Edinburgh)라는 표현은 부인 자신이 스코틀랜드 남작령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된 것이다. 구두상으로 스코틀랜드 남작은 단순히 영지 이름인 '에든버러'(Edinburgh)로 불리거나, 다른 수식어 없이 '남작'(Baron)으로 불릴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제3자를 지칭할 때는 '남작 오브 [X]' 또는 단순히 '[X]'를 사용한다.
스코틀랜드 남작은 여권의 성명란에 '[성] 오브 [영토 명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비고란에는 '소지자는 [이름] [성] 에든버러 남작임'(The holder is [Given Names] [Surname] Baron of [Territorial Designation])이라고 기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문장원(Court of the Lord Lyon)으로부터 자신의 봉건 남작령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버크 귀족 명감(Burke's Peerage)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20][21]
3. 2. 기타 국가
'''프랑스'''앙시앵 레짐 시대 프랑스의 남작령은 스코틀랜드 남작령과 유사했다. 봉건 남작령을 소유한 프랑스 귀족은 남작(baron)으로 불릴 자격이 있었으나, 평민 영주는 단지 남작령 영주(seigneur de la baronnie)로 불렸다. 남작령은 1789년 국민제헌의회가 봉건제를 폐지할 때까지 자유롭게 매매될 수 있었다. 남작 칭호는 법복 귀족이나 고유 칭호가 없는 검의 귀족의 차남 등 많은 귀족들이 예칭(titre de courtoisie)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나폴레옹 황제(1804~1815년 재위)는 1808년 새로운 제1제정 귀족 제도를 만들면서 남작을 두 번째로 낮은 작위로 두었다. 이 작위는 남성에게만 상속되었고 매매는 불가능했다.
1815년 루이 18세는 영국 상원을 모델로 귀족 제도와 귀족원을 재건했다. 남작은 가장 낮은 작위였지만, 1789년 이전 남작의 상속자, 자작의 장남, 백작의 차남 등은 남작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귀족 제도는 1848년에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네덜란드'''
중세 시대 저지대 국가의 일부 자유 보유지와 봉토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 남작령으로 지정되거나 인정받았다.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남부 네덜란드에서 남작 작위를 계속 수여했는데, 이는 새로운 영토 하사보다는 기존 칭호의 격상에 가까웠다.
1815년 이후 네덜란드 왕국에서는 이전 군주들이 인가한 남작 작위(나폴레옹 시대 홀란드 왕국 작위 제외)가 일반적으로 국왕에 의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귀족 최고 위원회의 인증과 군주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였으며, 1983년 헌법 개정 이후로는 불가능해졌다. 100개 이상의 네덜란드 남작 가문이 인정받았다. 작위는 보통 직계 남성 후손에게 상속되지만, 가문에 따라 분가 구성원에게 주어지거나 장자 상속 원칙을 따르기도 한다.
'''벨기에'''
1830년 네덜란드로부터 분리 독립한 후, 벨기에는 1815년 이후 네덜란드가 인정한 벨기에 시민의 남작 작위를 그대로 귀족 계급에 포함시켰다. 벨기에 군주는 이후에도 남작 작위를 포함한 귀족 작위를 수여할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벨기에 귀족 제도에서 남작은 기사(chevalier, ridder)보다 높고 자작보다 낮은 세 번째 작위이다. 현재도 벨기에에는 남작 작위를 가진 많은 가문이 존재한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군주는 남작 작위를 수여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총리였던 빅토르 드 토르나코와 펠릭스 드 블로차우젠은 재임 기간 중 남작 작위를 받아 이를 사용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
노르웨이에서는 마그누스 6세(1238–1280) 국왕이 기존의 렌드만 작위를 남작으로 대체했으나, 1308년 호콘 5세가 이 작위를 폐지했다.
현재 남작에 해당하는 작위는 덴마크 귀족과 노르웨이 귀족에서는 남작(baron)이며, 스웨덴 귀족에서는 남작(friherre)(구두상으로는 남작(baron)을 사용하지만 서면 표기는 남작(friherre)), 핀란드 귀족에서는 남작(vapaaherra)이다.
'''핀란드'''

초기 핀란드 귀족들은 별도의 작위 없이 단순히 영주로 불렸다. 중세부터 귀족 가문의 수장은 핀란드의 모든 지방 의회와 왕국의 귀족원, 신분 의회에서 투표권을 가졌다. 1561년 스웨덴의 에리크 14세 국왕이 일부 귀족에게 백작과 남작(vapaaherra)의 세습 작위를 수여했다. 이들의 방계 가족 구성원은 의회 투표권이나 참석 자격은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가문 수장과 동일한 작위를 가졌고 관습적으로는 남작(Paroni) 또는 남작 부인(Paronitar)으로 불렸다. 16-17세기에는 남작 지위로 격상된 가문에게 봉토 내 남작령이 부여되어 일부 과세 및 사법적 권한을 누렸다. 이후 남작령은 명목상의 지위가 되어 가문의 재산에 부속되거나 세습 재산으로 묶이기도 했다. 토지 재산에 대한 면세 혜택은 20세기까지 이어졌으나 19세기 세금 개혁으로 축소되었다. 귀족 작위 수여는 핀란드 대공국 군주제가 끝나는 1917년까지 계속되었다.
'''러시아'''
러시아 차르국에는 전통적인 남작 작위가 없었으나, 러시아 제국 시대 표트르 대제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가 도입한 귀족 계급에서 남작(барон)은 일반 귀족보다 높고 백작(граф, graf)보다 낮았다. 러시아 남작에게는 "귀하의 고귀함"(Ваше благородие, Vashe blagorodiye)과 "주 남작"(Господин барон, Gospodin baron)이라는 경칭이 사용되었다.
러시아의 남작 작위 보유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러시아가 기존 작위를 인정한 발트 독일인 귀족이었고, 다른 하나는 1721년 이후 러시아 황제가 새롭게 만든 남작들이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새로운 남작 작위는 부유한 부르주아를 귀족으로 편입시키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남작 작위는 다른 귀족 계급과 함께 1917년 12월 볼셰비키 혁명 이후 폐지되었으나, 표트르 브란겔 남작이나 로만 폰 운게른슈테른베르크 남작과 같은 백군 지도자들은 러시아 내전이 끝날 때까지 이 작위를 계속 사용했다.
4. 대중문화 속 남작
남작과 남작 부인은 다양한 소설 작품에 등장한다. 가상의 남작과 남작 부인에 대한 예시는 가상 귀족 목록#남작 및 남작 부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조
[1]
서적
Telling Tales: The Impact of Germany on English Children's Books 1780–1918
Open Book Publishers
2020-10-07
[2]
문서
servos militum, qui utique stultissimi sunt, servos videlicet stultorum
[3]
문서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etymonlin[...]
[4]
서적
Feudal Military Service in England: A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nd Military Powers of the 'Barones' in Medieval England
Oxford
[5]
서적
Four Gothic Kings
[6]
웹사이트
Théâtre de tous les peuples et nations de la terre avec leurs habits et ornemens divers, tant anciens que modernes, diligemment depeints au naturel par Luc Dheere peintre et sculpteur Gantois[manuscript]
https://lib.ugent.be[...]
2020-08-25
[7]
서적
Titles of Honor: By the Late and Famous Antiquary John Selden of Inner Temple, Esquire.
Thomas Dring
[8]
서적
Titles: How the King became His Majesty
https://archive.org/[...]
Barnes & Noble
[9]
웹사이트
1660 Abolition Act
http://www.legislati[...]
2013-05-04
[10]
서적
Poetry Speaks: Hear Great Poets Read Their Work from Tennyson to Plath
Sourcebooks MediaFusion
[11]
웹사이트
Forms of Address – Barons and their Wives
http://www.debretts.[...]
Debrett's
2013-08-10
[12]
웹사이트
British Titles – Baron
http://www.burkes-pe[...]
Burke's Peerage
2013-08-10
[13]
웹사이트
Forms of Address – Baroness in Her Own Right and Life Baroness
http://www.debretts.[...]
Debrett's
2013-08-10
[14]
웹사이트
British Titles – Lady
http://www.burkes-pe[...]
Burke's Peerage
2013-08-10
[15]
웹사이트
The Court of the Lord Lyon – News
http://www.lyon-cour[...]
2013-08-10
[16]
웹사이트
The Court of the Lord Lyon
http://www.lyon-cour[...]
2010-01-07
[17]
웹사이트
Forms of Address
http://www.peerage.o[...]
2017-03-13
[18]
웹사이트
Titles and Usages
http://www.scotsbaro[...]
2017-03-13
[19]
웹사이트
Forms of Address – Scottish Feudal Baronies
http://www.debretts.[...]
Debrett's
2013-08-10
[20]
간행물
Titles included in passports
https://www.gov.uk/g[...]
HM Government
2017-03-13
[21]
간행물
Observations in passports
https://www.gov.uk/g[...]
HM Government
2018-01-12
[22]
서적
Genealogisches Handbuch des Adels Furstliche Hauser Band XVI
C.A. Starke Verlag
[23]
문서
広辞苑 第六版
岩波書店
[24]
웹사이트
大辞林 第三版 奈良華族 (コトバンク)
https://kotobank.jp/[...]
[25]
문서
明治維新後に僧侶の妻帯は自由とされたが、それ以前には「無戒」の立場が広く公認された真宗を除き、具足戒により僧侶が公に妻子を持つことはできなかった。
[26]
웹사이트
The Peerage of Scotland
http://www.cracrofts[...]
2016-03-04
[27]
웹사이트
Lords of Scotland
http://www.cracrofts[...]
2016-02-21
[28]
웹사이트
Noble Titles in Spain and Spanish Grandees
https://web.archive.[...]
[29]
문서
https://www.boe.es/d[...]
[30]
문서
https://www.boe.es/b[...]
[31]
뉴스
バッハ会長は「ぼったくり男爵」米紙がIOC批判
https://news.tv-asah[...]
テレビ朝日
2021-07-2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