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친왕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흥친왕 이재면은 흥선대원군의 아들로, 1845년에 태어나 1912년에 사망했다. 그는 고종 즉위 후 관직에 올라 여러 요직을 거쳤으며, 갑신정변 당시 개화파와 교류하기도 했다. 1900년 완흥군에 봉해졌으며, 1907년에는 대한제국 육군 부장에 임명되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참여하여 흥친왕에 봉해졌고, 이후 공작이 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으며, 83만 엔의 은사금 수령으로 논란이 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제국의 친왕 - 의친왕
고종의 다섯째 아들이자 순종의 이복 동생인 의친왕은 대한제국의 황족으로서 독립운동에 투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며 광복 후에는 남북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한 독립운동가이다. - 대한제국의 친왕 - 의민태자
의민태자는 고종과 순헌황귀비 엄씨 사이에서 태어난 대한제국 최후의 황태자로, 영친왕 책봉 후 황태자가 되었으나 일본 유학 및 군 복무, 일본 황족과의 정략결혼, 광복 후 국적 미인정으로 일본에서 생활하다 귀국 후 영원에 안장되었으며 사후 의민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 한국의 귀족 - 양반
양반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지배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문반과 무반에서 유래하여 조선 시대에는 사족과 유사한 의미로 확대되었으며, 관료뿐 아니라 그 가족과 후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교적 가치관과 특권을 누렸으나, 갑오개혁으로 법적 특권은 소멸되었고 현대에는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 한국의 귀족 - 반복해
반복해는 고려 우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렸지만 역모를 꾀하다 처형당하고 재산이 몰수된 인물이다. - 19세기 한국의 군주 - 고종 (대한제국)
고종은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며,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거쳐 친정을 시작하여 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열강의 각축 속에서 국권을 잃고 강제 퇴위당했다. - 19세기 한국의 군주 - 문조 (조선)
문조는 조선의 추존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로, 순조의 맏아들로서 효명세자에 책봉되어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으며, 문학과 예술에 능해 왕실 문화 발전에 기여했으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여 사후 익종으로 추존되고 고종 때 문조 익황제로 다시 추존되었다.
| 흥친왕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작위 | 흥친왕 (興親王) 또는 완흥군 (完興君) |
| 본관 | 전주 이씨 |
| 휘 | 이재면 (李載冕) |
| 초명 | 이재록 (李載錄) |
| 자 | 무경 (武卿) |
| 호 | 우석 (又石) |
| 시호 | 없음 |
| 출생 | 1845년 8월 22일 (음력 7월 20일) |
| 출생지 | 조선 한성부 안국방 운현궁 |
| 사망 | 1912년 9월 9일 (68세) |
| 사망지 | 일제강점기 조선 경성부 안국정 운현궁 |
| 묘소 | 흥친왕릉 → 흥원 (興園) |
| 매장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 거주지 | 운현궁 |
| 국적 | 조선, 대한제국, 일본 제국 |
| 종교 | 유교(성리학) |
| 가족 관계 | |
| 아버지 | 흥선대원군 이하응 |
| 어머니 | 여흥부대부인 민씨 |
| 형제 | 대한제국 고종 (동생), 이재선(이복 형제), 흥인군(백부) |
| 배우자 | 풍산 홍씨, 여주 이씨, 첩 1명 |
| 자녀 | 이준용, 이문용 |
| 왕족 정보 | |
| 작위 | 완흥군 |
| 재위 기간 | 1900년 ~ 1910년 |
| 작위 | 흥친왕 |
| 재위 기간 | 1910년 8월 15일 ~ 1910년 8월 29일 |
| 작위 | 공 |
| 재위 기간 | 1910년 8월 29일 ~ 1912년 |
| 후임 | 이준용 |
| 군사 경력 | |
| 복무 | 대한제국 육군 |
| 복무 기간 | 1907년 11월 27일 ~ 1910년 10월 |
| 계급 | 육군 부장 (副將) |
| 지휘 | 대한제국 육군 |
| 훈장 | |
| 서훈 | 대한제국 대훈위 금척대수장 대한제국 대훈위 서성대수장 대한제국 대훈위 이화대수장 |
| 기타 정보 | |
| 개명 | 이희 (李熹) |
2. 생애
흥친왕(興親王)은 1845년 8월 22일 (음력 7월 20일) 한성부 사동(寺洞) 사저에서 흥선대원군과 여흥부대부인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재록(載錄)이었다가 뒤에 재면으로 고쳤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이희공실록에 의하면 그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진 이름은 재록이었다 한다. 헌종과 철종이 연이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이재면 역시 유력 왕위계승권자로 지목되었으나, 철종이 사망할 무렵 그는 성인이었기에 왕위계승권 서열에서 밀리게 되었다.
이는 철종 사망 당시 12세의 미성년자였던 이명복(흥선대원군의 차남)이 성인인 흥친왕보다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는 흥선대원군의 계략과 조대비의 묵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일부를 포섭할 때, 김병학의 딸, 혹은 김병문의 딸 중에서 둘째 아들인 명복의 배필로 맞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것 역시 재면 보다는 명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한때 그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의해 큰아버지 흥완군 이정응의 양자로 보내지는 것이 고려되기도 했다. 그의 흥완군 양자 지정 논란은 1864년 고종에 의해 취소되어 최종 종결되었다.
친동생 명복이 있었고, 그 외에도 서출 출신 이복형 이재선과 이윤용의 처가 된 이씨가 있었다. 한때 이재선은 그의 동생으로 알려졌다가 이재선 모역 사건 당시의 심문, 추궁, 재판기록이 나타나면서 이재선이 그보다 연장자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1863년 관직에 올랐고, 그 해 사용(司勇)이 되었다.[10] 11월 인정전(仁政殿)에서 철종이 감제(柑製[11])를 친히 주관할 때 1등하여, 바로 과거에 직부전시(直赴殿試)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다.
철종 치세기간 중 흥선대원군은 일부러 어리석음을 가장하여 김병기에게 아들 이재면의 관직을 청탁하기도 했다. 윤효정은 흥선군이 김병기에게 그의 과거 합격 청탁을 했다 한다. 흥선군은 일부러 김병기를 찾아가 아들 이재면의 문과 합격을 청탁했는데, 김병기는 마음 속으로는 몰지각함과 비열함을 비웃으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다.[9] 흥선군은 똑같이 김병기의 외조카 남병철에게도 똑같이 아들의 등과 합격을 청탁하니, 남병철은 몹시 분개했다. 왕실의 금지옥엽인데, 이렇게 초라해진 형편으로 아들의 등과를 청탁하니 이렇게 어리석을 데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다.[9] 그런데 박제형의 근세조선정감에는 흥선군을 대놓고 멸시하던 인물의 한 사람으로 남병철을 지목했다.
1863년 12월 동생 재황이 후사없이 죽은 철종의 뒤를 이어 조선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바로 승후관부사용(承候官付司勇)에 제수되었다. 1864년 5월 문과에 급제하여 그날로 규장각 대교(待敎)에 임명되었고, 여러 고위 관직을 거쳤다. 그해 8월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다시 그를 아들 없이 죽은 형 흥완군의 양자로 보냈다. 그러나 대왕대비 조씨의 특명으로 다른 종친의 자제를 흥완군의 양자로 하도록 하고, 이재면의 양자 입양은 취소되었다.
이후 고종 집권 초기에 삼사(三司)에서 한림(翰林)과 주서(注書)를 역임하고 예문관검열과 언관직을 거친 뒤에 규장각시교, 예문관검열, 승정원주서 등을 지냈다.
1865년(고종 2년) 1월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승정원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1월 15일 철종의 빈전의 향관(享官)으로 추가 선출되었다. 이후 다시 승정원동부승지가 됐다가 4월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부제학 등을 거쳐 이후 성균관대사성·승정원도승지ㆍ이조참의ㆍ호조참의ㆍ예조참의, 부제학, 직제학 등을 역임했다.
1866년 3월 약방 부제조[12]가 되었다.
1866년 도승지, 1867년에는 직제학이 됐다가 그해 3월 가선대부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승진하였고, 바로 이조참판이 되었다. 이후 동지경연사, 종정경에 제수되었고, 의정부 당상을 역임하였다. 그 뒤 병조판서, 금위대장,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1873년 종정경(宗正卿)이 되었으나 1874년 11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에 의해 섭정직에서 강제 축출당한 뒤에도 그는 유유하고 고분고분한 성격 덕에 계속 관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동생이 국왕이었고 아버지는 섭정인데도 자신에게는 낮은 직위가 부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기도 했다. 이때문에 그는 한때 명성황후 측에 가담하기도 했다. 외가인 민씨 척족에게 아부한 것 역시 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1878년(고종 16년) 자헌대부로 승진하여 지경연사(知經筵事)가 되었고, 종정부, 춘추관, 의금부사를 겸임하였으며, 1879년 형조판서(刑曹判書), 시강원 우부빈객(侍講院右副賓客), 시강원 좌빈객, 별입직(別入直)을 거쳐 종1품으로 특서되었다. 그해 숭정대부에 승진하여 행 병조판서가 되었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1880년 병조판서, 1881년 1월 금위대장,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등을 지냈다. 이어 1월 말 판돈녕부사로 통리기무아문당상, 사대교린당상(事大交隣堂上)에 올라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냈다. 그해 숭록대부로 승진하였다.
1881년 4월 시강원 우빈객(侍講院右賓客)이 되고 이후 금위대장과, 지훈련원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해 10월 이재선의 옥사가 있자 상소를 올려 이재선의 적형임을 들어 스스로 죄를 청하였고, 곧 사직했다. 그 뒤 이재선의 옥사 관련자들에게 역적의 율로 다스려야 된다는 사헌부와 사간원 및 성균관 유생들의 비난을 받을 때 그는 역모 가담자의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특별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1882년 3월 보국숭록대부로 승진, 행 예조판서가 되고, 호조판서를 겸하였다. 이어 훈련대장, 선혜청 당상, 판삼군부사를 역임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으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다시 섭정으로 재추대되자 일시적으로 무위대장(武衛大將)으로 사태수습에 힘썼다. 호조판서,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훈련대장을 겸하였다.[13]
1882년 7월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어 청나라에 호송, 톈진의 보정부(保定府)에 억류되어 감금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는 대원군의 텐진 납치기간 중 아버지와 서신 연락을 주고받았다.[13]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군인과 문인들의 굴욕과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비밀리에 국내에 편지 서신을 보내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1973년 10월 4일 대한민국 월간 문학사상 자료 조사연구실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편지를 쓸때 그는 순 한글체로 썼는데, 이는 한자나 영어로 썼다가는 발각되었을 때 청나라의 군인들이 해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13]
흥선대원군은 텐진의 보정부에 감금된 뒤에도 몰래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인편을 통해 고국으로 부쳤다. 민승호의 양자 민영익은 흥선대원군이 민승호 일가를 폭탄테러로 죽였다고 단정하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13]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대원군은 바로 비밀편지를 작성하여 아들 이재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13]
대원군의 구조 요청을 비밀리에 접한 흥친왕은 배편으로 1884년 6월부터 텐진의 보정부로 왕래하였다. 그해 12월 그는 인천항을 출국, 청나라에 유폐중이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1883년 3월에 일시 귀국하였다. 다시 그해 5월에 다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봉양하다 귀국하였다.
1885년 민씨 정권이 친러, 친일 등의 성향을 보이며 청나라를 견제하려 하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청나라 정부와 위안스카이 등의 정치적 계산으로 4년여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15] 1887년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와 결탁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큰 아들 이재면을 옹립하여 재집권하려다가 실패하였다.[10] 이재선과 이재면을 옹립하려던 추대기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흥선대원군은 장손인 이준용을 추대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준용 추대 시도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흥친왕과 고종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1884년 김옥균, 홍영식, 서재필 등에 의해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개화파와도 인간 관계를 형성했던 그는 정변 내각의 의정부좌찬성(左贊成) 겸 좌우참찬이 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만에 진압되었고, 그도 좌찬성 겸 좌우참찬에서 해임되었다. 판종정경의 직위를 받았으나 갑신정변 당시 고위직에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민씨 일파의 공격을 받았으며, 정변 관련자들과 내통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불문율에 붙여진다. 그 후 흥친왕은 7년간 운현궁에서 칩거하였다.
1887년 12월 첫 부인 풍산홍씨와 사별하였다. 상처한 그는 57세에 20세인 여주이씨 이인구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주이씨는 그의 아들 이준용보다 13살 연하였고, 며느리인 광산 김씨보다도 5년 연하였다. 결국 운현궁의 살림은 며느리 광산 김씨의 몫이 되었다.[16]
1892년 봄, 운현궁에서 화약이 터지고 여러 건물에 장치된 화약이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황현은 명성황후를 배후로 지목하였다. 황현은 운현궁의 폭탄 테러 사건을 명성황후가 대원군 일가를 폭살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주장하였다.[17] 이때 흥선대원군의 사랑채와 이재면, 이준용 부자의 거처에도 폭약이 장치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되었다. 이는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승호에게 폭약을 보내 일가를 폭사시켰던 전례에 대한 정치적 보복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7]
1893년 그는 동학 농민군이 상경하여 경복궁 앞에서 복합상소운동을 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다. 정교는 1893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박광호를 소두로 하는 약 50명의 동학교도들이 상경하여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탄원하며 연좌시위를 벌인 사건을 대원군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정교는 대원군이 은밀히 동학당 수만 명을 서울로 불러 모임을 갖고 장차 불궤를 도모하여 그의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였다.[17]
1895년(고종 32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난에 가담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제거되자, 그는 흥선대원군과 주한일본공사관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밀약에 의해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의 궁내부대신이 되었다.[10][18]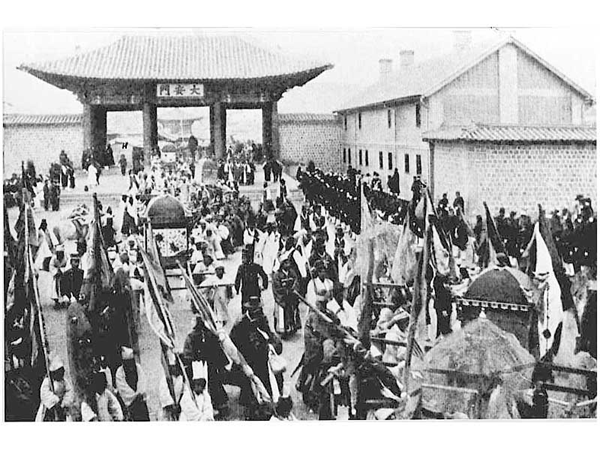
명성황후의 국장 때 그는 종척 집사(宗戚執事)로 임명되었고, 빈전에서 왕과 왕자들이 곡을 할 때 왕의 가까운 친척으로써 상복을 입고 곡하는 반열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2월 초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사퇴한 뒤, 총호사(總護使)에 임명됐다가 2월 중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퇴거,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파면되었다.
이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임명되었다. 1898년 1월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에 이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임종을 지켰다. 흥선대원군은 죽기 직전 어가가 대궐을 떠났느냐며 고종의 행차 여부를 물었으나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흥선대원군이 사망한 직후에도 고종에게 아버지의 임종을 알렸다가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하였다.
1900년(광무 4년) 4월 완흥군(完興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을미사변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언관들의 탄핵을 받았다. 이재면이 을미사변에는 직접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으나, 을미사변으로 생겨난 제1차 김홍집 내각에서 궁내부 대신을 역임한 것이 비난의 이유였다. 한동안 벼슬이 없던 그는 생활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19]
1902년 일본에 망명중인 장남 이준용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요청을 받자 그는 임정규를 통해 충분하지 못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다.[20] 1907년까지 이재면은 별다른 관직도 직업도 없이 생계가 곤란하였다. 하지만 이준용은 망명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아버지 이재면을 내심 원망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재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왕족으로 예우함과 동시에 그를 회유하려 하였다. 1907년 그는 동생 고종으로부터 대훈이화장(大勳李花章), 서성장(瑞星章)을 받았고, 1907년 11월 27일 대한제국 육군 부장(副將)에 임명됐다. 이어 일본에 보내는 특별보빙사절단에 임명되고, 아들 이준용은 육군 참장에 임명되어 수행원이 되었다. 그해 11월 보빙사절단 과 수행원 이준용, 이달용 등을 대동하고 일본 도쿄에 다녀왔다.
1909년 대훈금척대수장(大勳金尺大綬章)을 받았다.
1910년 8월 15일 한일합방 조약 서명을 불과 수일 앞두고 흥왕(興王)에 봉해져 이름을 이재면에서 이희(李熹)로 고치고, 합방 공포 하루 전인 28일에 책봉식을 가졌다. 책봉식 다음날 일제에 의해 왕에서 강등, 세습할 수 있는 공(公)족으로 분류되어 이희 공(李熹公)에 봉해졌다.[3]
그러나 당시 이미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의 지위에 있던 아들 이준용은 그의 작위와는 상관없이 남작의 지위를 받았다. 한일 합방 직후 막대한 양의 합방 공채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 별도로 협력하거나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1910년 8월 15일, 흥왕에 봉해져, 이희로 개명했다. 이 때문에 바로 뒤의 한국 병합 후에는 공의 칭호를 받아, 이희공이라고 불렸다.
1910년 6월부터 한국 병합을 도왔다. 1910년 8월 15일, 이희는 흥친왕이 되었다. 그는 한국을 병합하는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이는 매우 굴욕적인 조약으로, 사실상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는 병합 이후 공작 이희로 봉해졌으며, 한국 병합에 대한 보상으로 83만 원을 받았으며, 한국 병합 기념 장식을 받았다. 그의 작위는 이준용에게 상속되었다.[3] 부인은 공비 이씨이다.
1912년 9월 병세가 위독해졌고 순종은 전의(典醫)를 그의 집에 보내 왕진(往診)을 시켰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고종은 자신의 어의(御醫)를 보내 흥친왕을 진료하게 했다. 그러나 병세는 심해져 1912년 양력 9월 9일에 67세를 일기로 운현궁 정침에서 병사하였다. 어떤 병으로 사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죽으면서 그의 공작 지위는 아들 이준용이 상속하였다. 소생으로 영선군 이준용, 이문용과 딸 1명을 두었다. 흥친왕이 죽자 고종은 친히 그의 빈소에 가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였다.
처음 그의 시신은 경기도 김포군 고란대면(古蘭臺面) 풍곡리 야산 좌곤(坐坤)에 안장되었다가, 1921년 9월 1일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후일의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이장되었다. 이때 처음 광주군 세촌면 수곡리 계좌에 안장되었다가 다시 양주군 회암면 회암리(후일의 회천읍 회암리)에 안장되었던 부인 풍산홍씨 역시 이장되어 합장되었다. 그의 묘소 북서편, 이우의 묘소 우측 언덕에 후일 흥선대원군 내외의 묘소가 이장, 조성되었다.
2. 1. 생애 초반
흥친왕(興親王)은 1845년에 집권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권한이 없었던 흥선대원군의 아들로 태어났다.1864년 과거 문과에 급제했다.[3] 그는 흥선대원군의 섭정 아래 관료로 활동했다. 그는 중국에 갇힌 그의 아버지를 방문했다.[3] 고종이 권력을 잡고 김홍집이 총리로 임명된 후, 이희는 내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다.[4]
1900년 5월, 이희는 완흥군(完興君)이 되었다. 그는 고종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 이후인 1907년에 금척대훈장과 서성대훈장을 받았다. 1907년 11월, 이희는 육군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 외교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욱일대수장 1등급을 받았다. 1909년 이희는 금사대훈장을 받았다. 그는 1910년 6월부터 한국 병합을 도왔다. 1910년 8월 15일, 이희는 흥친왕이 되었다. 그는 한국을 병합하는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그는 병합 이후 공작 이희로 봉해졌다. 그는 한국 병합에 대한 보상으로 83만 원을 받았으며, 한국 병합 기념 장식을 받았다. 그의 작위는 이준용에게 상속되었다.[3]
1845년, 대원군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씨 조선 시대에는 완흥군에 봉해졌다. 1864년, 시험을 거쳐 임관했다. 1902년에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장남 이준용으로부터 생활비를 요청받자 지원했다. 1910년 8월 15일, 흥왕에 봉해져, 이희로 개명했다. 이 때문에 바로 뒤의 한국 병합 후에는 공의 칭호를 받아, 이희공이라고 불렸다. 부인은 공비 이씨이다.
2. 1. 1. 출생과 가계
흥친왕 이재면은 1845년 8월 22일 (음력 7월 20일) 한성부 사동(寺洞) 사저에서 흥선대원군과 여흥부대부인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처음 이름은 재록(載錄)이었다가 뒤에 재면으로 고쳤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이희공실록에 의하면 그가 태어나자마자 지어진 이름은 재록이었다 한다. 헌종과 철종이 연이어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이재면 역시 유력 왕위계승권자로 지목되었으나, 철종이 사망할 무렵 그는 성인이었기에 왕위계승권 서열에서 밀리게 되었다.이는 철종 사망 당시 12세의 미성년자였던 이명복(흥선대원군의 차남)이 성인인 흥친왕보다 조종하기 쉬울 것이라는 흥선대원군의 계략과 조대비의 묵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안동 김씨의 일부를 포섭할 때, 김병학의 딸, 혹은 김병문의 딸 중에서 둘째 아들인 명복의 배필로 맞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것 역시 재면 보다는 명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한때 그는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의해 큰아버지 흥완군 이정응의 양자로 보내지는 것이 고려되기도 했다. 그의 흥완군 양자 지정 논란은 1864년 고종에 의해 취소되어 최종 종결되었다.
친동생 명복이 있었고, 그 외에도 서출 출신 이복형 이재선과 이윤용의 처가 된 이씨가 있었다. 한때 이재선은 그의 동생으로 알려졌다가 이재선 모역 사건 당시의 심문, 추궁, 재판기록이 나타나면서 이재선이 그보다 연장자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1864년, 시험을 거쳐 임관했다. 1902년에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장남 이준용으로부터 생활비를 요청받자 지원했다.
2. 1. 2. 관직에 오르다
1863년 관직에 올랐고, 그 해 사용(司勇)이 되었다.[10] 11월 인정전(仁政殿)에서 철종이 감제(柑製[11])를 친히 주관할 때 1등하여, 바로 과거에 직부전시(直赴殿試)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다.철종 치세기간 중 흥선대원군은 일부러 어리석음을 가장하여 김병기에게 아들 이재면의 관직을 청탁하기도 했다. 윤효정은 흥선군이 김병기에게 그의 과거 합격 청탁을 했다 한다. 흥선군은 일부러 김병기를 찾아가 아들 이재면의 문과 합격을 청탁했는데, 김병기는 마음 속으로는 몰지각함과 비열함을 비웃으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한다.[9] 흥선군은 똑같이 김병기의 외조카 남병철에게도 똑같이 아들의 등과 합격을 청탁하니, 남병철은 몹시 분개했다. 왕실의 금지옥엽인데, 이렇게 초라해진 형편으로 아들의 등과를 청탁하니 이렇게 어리석을 데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었다.[9] 그런데 박제형의 근세조선정감에는 흥선군을 대놓고 멸시하던 인물의 한 사람으로 남병철을 지목했다.
1864년, 시험을 거쳐 임관했다.
2. 2. 관료 생활
1863년 12월 동생 재황이 후사없이 죽은 철종의 뒤를 이어 조선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바로 승후관부사용(承候官付司勇)에 제수되었다. 1864년 5월 문과에 급제하여 그날로 규장각 대교(待敎)에 임명되었고, 여러 고위 관직을 거쳤다. 그해 8월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다시 그를 아들 없이 죽은 형 흥완군의 양자로 보냈다. 그러나 대왕대비 조씨의 특명으로 다른 종친의 자제를 흥완군의 양자로 하도록 하고, 이재면의 양자 입양은 취소되었다.이후 고종 집권 초기에 삼사(三司)에서 한림(翰林)과 주서(注書)를 역임하고 예문관검열과 언관직을 거친 뒤에 규장각시교, 예문관검열, 승정원주서 등을 지냈다. 1845년, 흥선대원군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씨 조선 시대에는 완흥군에 봉해졌다. 1864년, 시험을 거쳐 임관했다.
1865년(고종 2년) 1월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승정원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1월 15일 철종의 빈전의 향관(享官)으로 추가 선출되었다. 이후 다시 승정원동부승지가 됐다가 4월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부제학 등을 거쳐 이후 성균관대사성·승정원도승지ㆍ이조참의ㆍ호조참의ㆍ예조참의, 부제학, 직제학 등을 역임했다.
1866년 3월 약방 부제조[12]가 되었다.
1866년 도승지, 1867년에는 직제학이 됐다가 그해 3월 가선대부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승진하였고, 바로 이조참판이 되었다. 이후 동지경연사, 종정경에 제수되었고, 의정부 당상을 역임하였다. 그 뒤 병조판서, 금위대장,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1873년 종정경(宗正卿)이 되었으나 1874년 11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에 의해 섭정직에서 강제 축출당한 뒤에도 그는 유유하고 고분고분한 성격 덕에 계속 관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동생이 국왕이었고 아버지는 섭정인데도 자신에게는 낮은 직위가 부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기도 했다. 이때문에 그는 한때 명성황후 측에 가담하기도 했다. 외가인 민씨 척족에게 아부한 것 역시 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1878년(고종 16년) 자헌대부로 승진하여 지경연사(知經筵事)가 되었고, 종정부, 춘추관, 의금부사를 겸임하였으며, 1879년 형조판서(刑曹判書), 시강원 우부빈객(侍講院右副賓客), 시강원 좌빈객, 별입직(別入直)을 거쳐 종1품으로 특서되었다. 그해 숭정대부에 승진하여 행 병조판서가 되었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1880년 병조판서, 1881년 1월 금위대장,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등을 지냈다. 이어 1월 말 판돈녕부사로 통리기무아문당상, 사대교린당상(事大交隣堂上)에 올라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냈다. 그해 숭록대부로 승진하였다.
1881년 4월 시강원 우빈객(侍講院右賓客)이 되고 이후 금위대장과, 지훈련원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해 10월 이재선의 옥사가 있자 상소를 올려 이재선의 적형임을 들어 스스로 죄를 청하였고, 곧 사직했다. 그 뒤 이재선의 옥사 관련자들에게 역적의 율로 다스려야 된다는 사헌부와 사간원 및 성균관 유생들의 비난을 받을 때 그는 역모 가담자의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특별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1882년 3월 보국숭록대부로 승진, 행 예조판서가 되고, 호조판서를 겸하였다. 이어 훈련대장, 선혜청 당상, 판삼군부사를 역임했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으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다시 섭정으로 재추대되자 일시적으로 무위대장(武衛大將)으로 사태수습에 힘썼다. 호조판서,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훈련대장을 겸하였다.[13]
1882년 7월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어 청나라에 호송, 톈진의 보정부(保定府)에 억류되어 감금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는 대원군의 텐진 납치기간 중 아버지와 서신 연락을 주고받았다.[13]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군인과 문인들의 굴욕과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비밀리에 국내에 편지 서신을 보내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1973년 10월 4일 대한민국 월간 문학사상 자료 조사연구실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편지를 쓸때 그는 순 한글체로 썼는데, 이는 한자나 영어로 썼다가는 발각되었을 때 청나라의 군인들이 해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13]
흥선대원군은 텐진의 보정부에 감금된 뒤에도 몰래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인편을 통해 고국으로 부쳤다. 민승호의 양자 민영익은 흥선대원군이 민승호 일가를 폭탄테러로 죽였다고 단정하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13]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대원군은 바로 비밀편지를 작성하여 아들 이재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13]
대원군의 구조 요청을 비밀리에 접한 흥친왕은 배편으로 1884년 6월부터 텐진의 보정부로 왕래하였다. 그해 12월 그는 인천항을 출국, 청나라에 유폐중이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1883년 3월에 일시 귀국하였다. 다시 그해 5월에 다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봉양하다 귀국하였다.
1885년 민씨 정권이 친러, 친일 등의 성향을 보이며 청나라를 견제하려 하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청나라 정부와 위안스카이 등의 정치적 계산으로 4년여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15] 1887년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와 결탁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큰 아들 이재면을 옹립하여 재집권하려다가 실패하였다.[10] 이재선과 이재면을 옹립하려던 추대기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흥선대원군은 장손인 이준용을 추대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준용 추대 시도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흥친왕과 고종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2. 2. 1. 관료 생활 초기
1863년 12월 동생 재황이 후사없이 죽은 철종의 뒤를 이어 조선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바로 승후관부사용(承候官付司勇)에 제수되었다. 1864년 5월 문과에 급제하여 그날로 규장각 대교(待敎)에 임명되었고, 여러 고위 관직을 거쳤다. 그해 8월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다시 그를 아들 없이 죽은 형 흥완군의 양자로 보냈다. 그러나 대왕대비 조씨의 특명으로 다른 종친의 자제를 흥완군의 양자로 하도록 하고, 이재면의 양자 입양은 취소되었다.이후 고종 집권 초기에 삼사(三司)에서 한림(翰林)과 주서(注書)를 역임하고 예문관검열과 언관직을 거친 뒤에 규장각시교, 예문관검열, 승정원주서 등을 지냈다. 1845년, 흥선대원군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씨 조선 시대에는 완흥군에 봉해졌다. 1864년, 시험을 거쳐 임관했다.
2. 2. 2. 대원군 섭정 기간
1865년(고종 2년) 1월 통정대부로 승진하여 승정원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가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1월 15일 철종의 빈전의 향관(享官)으로 추가 선출되었다. 이후 다시 승정원동부승지가 됐다가 4월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부제학 등을 거쳐 이후 성균관대사성·승정원도승지ㆍ이조참의ㆍ호조참의ㆍ예조참의, 부제학, 직제학 등을 역임했다.1866년 3월 약방 부제조[12]가 되었다.
1866년 도승지, 1867년에는 직제학이 됐다가 그해 3월 가선대부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승진하였고, 바로 이조참판이 되었다. 이후 동지경연사, 종정경에 제수되었고, 의정부 당상을 역임하였다. 그 뒤 병조판서, 금위대장, 이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1873년 종정경(宗正卿)이 되었으나 1874년 11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에 의해 섭정직에서 강제 축출당한 뒤에도 그는 유유하고 고분고분한 성격 덕에 계속 관직에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동생이 국왕이었고 아버지는 섭정인데도 자신에게는 낮은 직위가 부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기도 했다. 이때문에 그는 한때 명성황후 측에 가담하기도 했다. 외가인 민씨 척족에게 아부한 것 역시 관직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2. 2. 3. 대원군 축출 이후
1878년(고종 16년) 자헌대부로 승진하여 지경연사(知經筵事)가 되었고, 종정부, 춘추관, 의금부사를 겸임하였으며, 1879년 형조판서(刑曹判書), 시강원 우부빈객(侍講院右副賓客), 시강원 좌빈객, 별입직(別入直)을 거쳐 종1품으로 특서되었다. 그해 숭정대부에 승진하여 행 병조판서가 되었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1880년 병조판서, 1881년 1월 금위대장,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등을 지냈다. 이어 1월 말 판돈녕부사로 통리기무아문당상, 사대교린당상(事大交隣堂上)에 올라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냈다. 그해 숭록대부로 승진하였다.1881년 4월 시강원 우빈객(侍講院右賓客)이 되고 이후 금위대장과, 지훈련원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해 10월 이재선의 옥사가 있자 상소를 올려 이재선의 적형임을 들어 스스로 죄를 청하였고, 곧 사직했다. 그 뒤 이재선의 옥사 관련자들에게 역적의 율로 다스려야 된다는 사헌부와 사간원 및 성균관 유생들의 비난을 받을 때 그는 역모 가담자의 가까운 친족이었음에도 특별히 화를 면할 수 있었다. 1882년 3월 보국숭록대부로 승진, 행 예조판서가 되고, 호조판서를 겸하였다. 이어 훈련대장, 선혜청 당상, 판삼군부사를 역임했다.
2. 2. 4. 임오군란과 보정부 왕래
1882년 6월 임오군란으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다시 섭정으로 재추대되자 일시적으로 무위대장(武衛大將)으로 사태수습에 힘썼다. 호조판서, 선혜청당상(宣惠廳堂上),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 훈련대장을 겸하였다.[13]1882년 7월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납치되어 청나라에 호송, 톈진의 보정부(保定府)에 억류되어 감금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는 대원군의 텐진 납치기간 중 아버지와 서신 연락을 주고받았다.[13]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청나라 군인과 문인들의 굴욕과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비밀리에 국내에 편지 서신을 보내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1973년 10월 4일 대한민국 월간 문학사상 자료 조사연구실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편지를 쓸때 그는 순 한글체로 썼는데, 이는 한자나 영어로 썼다가는 발각되었을 때 청나라의 군인들이 해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13]
흥선대원군은 텐진의 보정부에 감금된 뒤에도 몰래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인편을 통해 고국으로 부쳤다. 민승호의 양자 민영익은 흥선대원군이 민승호 일가를 폭탄테러로 죽였다고 단정하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13]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대원군은 바로 비밀편지를 작성하여 아들 이재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13]
대원군의 구조 요청을 비밀리에 접한 흥친왕은 배편으로 1884년 6월부터 텐진의 보정부로 왕래하였다. 그해 12월 그는 인천항을 출국, 청나라에 유폐중이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1883년 3월에 일시 귀국하였다. 다시 그해 5월에 다시 청나라에 가서 흥선대원군을 봉양하다 귀국하였다.
2. 2. 5. 이재면 추대 미수 사건
1885년 민씨 정권이 친러, 친일 등의 성향을 보이며 청나라를 견제하려 하자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청나라 정부와 위안스카이 등의 정치적 계산으로 4년여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15] 1887년 청나라의 위안스카이와 결탁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큰 아들 이재면을 옹립하여 재집권하려다가 실패하였다.[10] 이재선과 이재면을 옹립하려던 추대기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흥선대원군은 장손인 이준용을 추대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준용 추대 시도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흥친왕과 고종 간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2. 3. 장년기
흥친왕(興親王)은 1845년에 집권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권한이 없었던 흥선대원군의 아들로 태어났다.1864년, 그는 과거 문과에 급제했다.[3] 그는 흥선대원군의 섭정 아래 관료로 활동했다. 그는 중국에 갇힌 그의 아버지를 방문했다.[3] 고종이 권력을 잡고 김홍집이 총리로 임명된 후, 이희는 내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다.[4]
1900년 5월, 이희는 완흥군(完興君)이 되었다. 그는 고종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 이후인 1907년에 금척대훈장과 서성대훈장을 받았다. 1907년 11월, 이희는 육군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 외교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욱일대수장 1등급을 받았다. 1909년, 이희는 금사대훈장을 받았다. 그는 1910년 6월부터 한국 병합을 도왔다. 1910년 8월 15일, 이희는 흥친왕이 되었다. 그는 한국을 병합하는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그는 병합 이후 공작 이희로 봉해졌다. 그는 한국 병합에 대한 보상으로 83만 원을 받았으며, 한국 병합 기념 장식을 받았다. 그의 작위는 이준용에게 상속되었다.[3]
1845년, 대원군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씨 조선 시대에는 완흥군에 봉해졌다. 1864년, 시험을 거쳐 임관했다. 1902년에 일본으로 망명 중이던 장남 이준용으로부터 생활비를 요청받자 지원했다. 1910년 8월 15일, 흥왕에 봉해져, 이희로 개명했다. 이 때문에 바로 뒤의 한국 병합 후에는 공의 칭호를 받아, 이희공이라고 불렸다. 부인은 공비 이씨이다.
1884년 김옥균, 홍영식, 서재필 등에 의해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개화파와도 인간 관계를 형성했던 그는 정변 내각의 의정부좌찬성(左贊成) 겸 좌우참찬이 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만에 진압되었고, 그도 좌찬성 겸 좌우참찬에서 해임되었다. 판종정경의 직위를 받았으나 갑신정변 당시 고위직에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민씨 일파의 공격을 받았으며, 정변 관련자들과 내통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불문율에 붙여진다. 그 후 흥친왕은 7년간 운현궁에서 칩거하였다.
1887년 12월 첫 부인 풍산홍씨와 사별하였다. 상처한 그는 57세에 20세인 여주이씨 이인구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주이씨는 그의 아들 이준용보다 13살 연하였고, 며느리인 광산 김씨보다도 5년 연하였다. 결국 운현궁의 살림은 며느리 광산 김씨의 몫이 되었다.[16]
1892년 봄, 운현궁에서 화약이 터지고 여러 건물에 장치된 화약이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황현은 명성황후를 배후로 지목하였다. 황현은 운현궁의 폭탄 테러 사건을 명성황후가 대원군 일가를 폭살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주장하였다.[17] 이때 흥선대원군의 사랑채와 이재면, 이준용 부자의 거처에도 폭약이 장치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되었다. 이는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승호에게 폭약을 보내 일가를 폭사시켰던 전례에 대한 정치적 보복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7]
1893년 그는 동학 농민군이 상경하여 경복궁 앞에서 복합상소운동을 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다. 정교는 1893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박광호를 소두로 하는 약 50명의 동학교도들이 상경하여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탄원하며 연좌시위를 벌인 사건을 대원군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정교는 대원군이 은밀히 동학당 수만 명을 서울로 불러 모임을 갖고 장차 불궤를 도모하여 그의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였다.[17]
1895년(고종 32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난에 가담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제거되자, 그는 흥선대원군과 주한일본공사관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밀약에 의해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의 궁내부대신이 되었다.[10][18]
명성황후의 국장 때 그는 종척 집사(宗戚執事)로 임명되었고, 빈전에서 왕과 왕자들이 곡을 할 때 왕의 가까운 친척으로써 상복을 입고 곡하는 반열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2월 초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사퇴한 뒤, 총호사(總護使)에 임명됐다가 2월 중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퇴거,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파면되었다.
이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임명되었다. 1898년 1월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에 이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임종을 지켰다. 흥선대원군은 죽기 직전 어가가 대궐을 떠났느냐며 고종의 행차 여부를 물었으나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흥선대원군이 사망한 직후에도 고종에게 아버지의 임종을 알렸다가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하였다.
2. 3. 1. 갑신정변의 실패와 은거
1884년 김옥균, 홍영식, 서재필 등에 의해 갑신정변이 발생하자, 개화파와도 인간 관계를 형성했던 그는 정변 내각의 의정부좌찬성(左贊成) 겸 좌우참찬이 되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3일만에 진압되었고, 그도 좌찬성 겸 좌우참찬에서 해임되었다. 판종정경의 직위를 받았으나 갑신정변 당시 고위직에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민씨 일파의 공격을 받았으며, 정변 관련자들과 내통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불문율에 붙여진다. 그 후 흥친왕은 7년간 운현궁에서 칩거하였다.1887년 12월 첫 부인 풍산홍씨와 사별하였다. 상처한 그는 57세에 20세인 여주이씨 이인구의 딸과 결혼하였다. 여주이씨는 그의 아들 이준용보다 13살 연하였고, 며느리인 광산 김씨보다도 5년 연하였다. 결국 운현궁의 살림은 며느리 광산 김씨의 몫이 되었다.[16]
2. 3. 2. 운현궁 칩거 생활 중
1892년 봄, 운현궁에서 화약이 터지고 여러 건물에 장치된 화약이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황현은 명성황후를 배후로 지목하였다. 황현은 운현궁의 폭탄 테러 사건을 명성황후가 대원군 일가를 폭살하기 위해 벌인 짓이라고 주장하였다.[17] 이때 흥선대원군의 사랑채와 이재면, 이준용 부자의 거처에도 폭약이 장치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각되었다. 이는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승호에게 폭약을 보내 일가를 폭사시켰던 전례에 대한 정치적 보복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7]1893년 그는 동학 농민군이 상경하여 경복궁 앞에서 복합상소운동을 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다. 정교는 1893년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박광호를 소두로 하는 약 50명의 동학교도들이 상경하여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탄원하며 연좌시위를 벌인 사건을 대원군이 시킨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정교는 대원군이 은밀히 동학당 수만 명을 서울로 불러 모임을 갖고 장차 불궤를 도모하여 그의 손자 이준용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였다.[17]
2. 3. 3. 을미사변 전후
1895년(고종 32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는 난에 가담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제거되자, 그는 흥선대원군과 주한일본공사관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의 밀약에 의해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의 궁내부대신이 되었다.[10][18]명성황후의 국장 때 그는 종척 집사(宗戚執事)로 임명되었고, 빈전에서 왕과 왕자들이 곡을 할 때 왕의 가까운 친척으로써 상복을 입고 곡하는 반열에 참여하였다. 이듬해 2월 초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사퇴한 뒤, 총호사(總護使)에 임명됐다가 2월 중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퇴거,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파면되었다.
이후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임명되었다. 1898년 1월 어머니 여흥부대부인에 이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임종을 지켰다. 흥선대원군은 죽기 직전 어가가 대궐을 떠났느냐며 고종의 행차 여부를 물었으나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흥선대원군이 사망한 직후에도 고종에게 아버지의 임종을 알렸다가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하였다.
2. 4. 생애 후반
1864년 문과에 급제했다. 흥선대원군의 섭정 아래 관료로 활동했으며, 중국에 갇힌 아버지를 방문했다.[3] 고종이 권력을 잡고 김홍집이 총리로 임명된 후, 이희는 내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다.[4]1900년 5월, 이희는 완흥군(完興君)이 되었다. 1907년에는 고종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 이후 금척대훈장과 서성대훈장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육군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외교관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욱일대수장 1등급을 받았다. 1909년에는 금사대훈장을 받았다.
1910년 6월부터 한국 병합을 도왔다. 1910년 8월 15일, 이희는 흥친왕이 되었다. 그는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이는 매우 굴욕적인 조약으로, 사실상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이었다. 그는 병합 이후 공작 이희로 봉해졌으며, 한국 병합에 대한 보상으로 83만 원을 받았으며, 한국 병합 기념 장식을 받았다. 그의 작위는 이준용에게 상속되었다.[3] 부인은 공비 이씨이다.
2. 4. 1. 대한제국 수립 이후
1900년(광무 4년) 4월 완흥군(完興君)에 봉해졌다. 그러나 을미사변의 관련자로 지목되어 언관들의 탄핵을 받았다. 이재면이 을미사변에는 직접 참여하거나 동조하지 않았으나, 을미사변으로 생겨난 제1차 김홍집 내각에서 궁내부 대신을 역임한 것이 비난의 이유였다. 한동안 벼슬이 없던 그는 생활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19]1902년 일본에 망명중인 장남 이준용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요청을 받자 그는 임정규를 통해 충분하지 못한 액수의 생활비를 지원하였다.[20] 1907년까지 이재면은 별다른 관직도 직업도 없이 생계가 곤란하였다. 하지만 이준용은 망명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아버지 이재면을 내심 원망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재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왕족으로 예우함과 동시에 그를 회유하려 하였다. 1907년 그는 동생 고종으로부터 대훈이화장(大勳李花章), 서성장(瑞星章)을 받았고, 1907년 11월 27일 대한제국 육군 부장(副將)에 임명됐다. 이어 일본에 보내는 특별보빙사절단에 임명되고, 아들 이준용은 육군 참장에 임명되어 수행원이 되었다. 그해 11월 보빙사절단 과 수행원 이준용, 이달용 등을 대동하고 일본 도쿄에 다녀왔다.
1909년 대훈금척대수장(大勳金尺大綬章)을 받았다.
2. 4. 2. 친왕 진봉과 강제 병합
1910년 8월 15일 한일합방 조약 서명을 불과 수일 앞두고 흥왕(興王)에 봉해져 이름을 이재면에서 이희(李熹)로 고치고, 합방 공포 하루 전인 28일에 책봉식을 가졌다. 책봉식 다음날 일제에 의해 왕에서 강등, 세습할 수 있는 공(公)족으로 분류되어 이희 공(李熹公)에 봉해졌다.[3]그러나 당시 이미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의 지위에 있던 아들 이준용은 그의 작위와는 상관없이 남작의 지위를 받았다. 한일 합방 직후 막대한 양의 합방 공채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 별도로 협력하거나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1910년 8월 15일, 흥왕에 봉해져, 이희로 개명했다. 이 때문에 바로 뒤의 한국 병합 후에는 공의 칭호를 받아, 이희공이라고 불렸다.
1910년 6월부터 한국 병합을 도왔다. 1910년 8월 15일, 이희는 흥친왕이 되었다. 그는 한국을 병합하는 한일 병합 조약에 서명했다. 그는 병합 이후 공작 이희로 봉해졌다. 그는 한국 병합에 대한 보상으로 83만 원을 받았으며, 한국 병합 기념 장식을 받았다. 그의 작위는 이준용에게 상속되었다.[3]
2. 4. 3. 사망
1912년 9월 병세가 위독해졌고 순종은 전의(典醫)를 그의 집에 보내 왕진(往診)을 시켰다. 덕수궁(德壽宮)에서도 고종은 자신의 어의(御醫)를 보내 흥친왕을 진료하게 했다. 그러나 병세는 심해져 1912년 양력 9월 9일에 67세를 일기로 운현궁 정침에서 병사하였다. 어떤 병으로 사망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가 죽으면서 그의 공작 지위는 아들 이준용이 상속하였다. 소생으로 영선군 이준용, 이문용과 딸 1명을 두었다. 흥친왕이 죽자 고종은 친히 그의 빈소에 가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였다.처음 그의 시신은 경기도 김포군 고란대면(古蘭臺面) 풍곡리 야산 좌곤(坐坤)에 안장되었다가, 1921년 9월 1일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후일의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이장되었다. 이때 처음 광주군 세촌면 수곡리 계좌에 안장되었다가 다시 양주군 회암면 회암리(후일의 회천읍 회암리)에 안장되었던 부인 풍산홍씨 역시 이장되어 합장되었다. 그의 묘소 북서편, 이우의 묘소 우측 언덕에 후일 흥선대원군 내외의 묘소가 이장, 조성되었다.
3. 사후
이재면의 거처는 운현궁의 영로당이었다. 그가 거처하던 운현궁의 영로당은 1917년 그의 아들 영선군 이준용이 오랜 병치레 끝에 사망하자, 이준용의 계실 광산 김씨가 그의 주치의에게 사례로 주었다 한다. 이 주치의는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영무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의 아버지이다. 두 번째 부인 여주이씨는 29세에 남편을 잃고 종친회의 도움으로 혼자 살아가다 1978년 1월 8일에 운현궁에서 사망했다.[21]
1920년 양주군 화도면 창현리(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로 이장되었다. 신도비는 1919년 5월 세워졌다. 초창기에는 이희공전화 신도비명이라고 세웠지만[22], 훗날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고 1948년 신도비를 다시 세울 때는 흥친왕신도비로 제목 3글자가 바뀌어져서 세워졌다.
한편 그의 아들 영선군 이준용은 아버지 흥친왕 이재면이 사망한 뒤에도 그는 빈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저씨뻘 되는 이재완 등에게 호된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 이는 국왕의 친형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신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자객들의 일본행도 막지 못한 점, 일본 망명 중에 아버지의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했고 집안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21]
2006년,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4. 논란
4. 1. 친일 행적 논란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 조약 체결에 관한 회의에서 대한제국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하는 데 가담[23][24][25]했다는 것이 그가 친일파로 지목된 이유였다. 그러나 흥친왕의 친일 행적이나 은사금 수령이 일제에 의한 회유책이지 흥친왕의 자발적인 행적은 아니라는 이견이 제기되어 왔다.2007년 1월 18일 이재면의 증손 이모씨가 자신의 증ㆍ조부의 행위를 친일행위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26]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구한말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의 행적을 친일행위로 규정해 발표하자, 2006년 11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4][27][28]
2009년 10월 5일 그의 증손이 낸 소송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다.[23] 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통한 후손의 인격권 침해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결정과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23][25]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도 수록되었다.
4. 2. 은사금 논란
흥친왕은 친일파나 적극적인 친일본 인사는 아니었으나, 한일 합방 직후 83만 엔(2010년 대한민국 기준 166억 원)이라는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29] 이는 을사오적 가운데 한 사람인 이완용이 받은 15만 엔, 정미칠적 가운데 한 사람인 송병준이 받은 10만 엔의 약 6, 7배에 해당되는 액수라 지탄받는 원인이 됐다.5. 가족 관계
흥친왕의 가족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아버지: 흥선대원왕
- 어머니: 여흥대원비 민씨
- 첫째 부인: 풍산 홍씨
- 장남: 영선군 이준용
- 며느리: 군부인 증 흥친왕비 남양 홍씨
- 양손자: 이우
- 양손부: 박찬주
- 며느리: 광산 김씨
- 첩며느리: 전순혁
- 서손녀: 이진완
- 서손녀사위: 윤원선
- 2남: 이문용
- 며느리: 정부인 김씨
- 장녀: 왕녀 이씨 (군수 김인규에게 출가)
- 2녀: 왕녀 이씨 (비서승 김두한에게 출가)
- 둘째 부인(계실): 흥친왕비 여주 이씨
- 첩실: 신안 주씨
- 3녀: 왕녀 이씨 (주사 김규정에게 출가)
- 동생: 고종
- 서모: 계성월
- 서형: 완은군 이재선
- 서형수: 군부인 신씨
- 서조카: 이관용
- 이복 여동생: 이씨
- 이복 매제: 이윤용
- 서모: 추선
분류:조선 흥선대원군 가계도
6. 상훈
흥친왕은 1907년 대한제국 대훈위 이화대수장과 대훈위 서성대수장을 수여받았다. 1909년에는 대한제국 대훈위 금척대수장을 받았다. 같은 해 일본 황태자 도한 기념장을 받았다. 1907년 (메이지 40년) 10월 30일 일본 대훈위서성대수장을 받았다.
참조
[1]
웹사이트
흥친왕의 이름을 희로 고치도록 하다
http://sillok.histor[...]
2020-07-21
[2]
웹사이트
대일본 천황이 조서를 내리다
http://sillok.histor[...]
2020-07-21
[3]
웹사이트
이재면(李載冕)
https://encykorea.ak[...]
2022-05-05
[4]
웹사이트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
2022-05-05
[5]
간행물
叙任及辞令
官報
1909-05-24
[6]
간행물
叙任及辞令
官報
1924-01-09
[7]
간행물
辞令二
官報
1941-10-23
[8]
문서
후에 화장되어 흥원 서북쪽 납골묘에 안장되었다.
[9]
서적
대한제국아 망해라: 백성들의 눈으로 쓴 살아 있는 망국사
다산초당
2010
[10]
웹사이트
http://enc.daum.net/[...]
[11]
문서
매년 감과 귤이 처음 열리는 날 직후에, 조선의 임금이 감귤 열리는 것을 기념하여 직접 주관하는 과거 시험이다.
[12]
서적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함께
2007
[13]
뉴스
경향신문
1973-10-04
[14]
문서
청나라로 오는 진주사
[15]
웹사이트
http://enc.daum.net/[...]
[16]
문서
며느리 광산 김씨 역시 아들 이준용의 재취였다.
[17]
서적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1)
경인문화사
2007-04
[18]
문서
제1차 김홍집 내각
[19]
뉴스
韓國의 名建物 (2) 雲峴宮
경향신문
1984-10-10
[20]
서적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1)
경인문화사
2007-04
[21]
서적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1)
경인문화사
2007-04
[22]
문서
초기의 탁본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3]
웹사이트
http://news.nate.com[...]
[24]
웹사이트
http://news.nate.com[...]
[25]
웹사이트
http://www.ytn.co.kr[...]
[26]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27]
웹사이트
http://www.fnnews.co[...]
[28]
웹사이트
보관된 사본
http://news.mk.co.kr[...]
2011-02-25
[29]
웹사이트
http://news.khan.co.[...]
[30]
서적
한국사 이야기 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2004
[31]
웹사이트
http://news.chosun.c[...]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