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일본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원정(院政)은 일본사에서 천황이 양위 후 '상황'(上皇)이 되어 정무를 후견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고대부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헤이안 시대 말기 시라카와 천황이 1086년 아들에게 양위하고 '시라카와인'으로 칭하며 정무를 계속 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세이는 천황의 권위를 유지하고 왕위 계승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으나, 셋칸 정치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고시라카와 법황, 고토바 상황 등 여러 상황들이 인세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며 무사 정권 시대를 거쳐 가마쿠라 막부 시대까지 이어졌다. 메이지 유신 이후 황실전범에 의해 천황의 생전 양위가 금지되면서 인세이는 종식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원정 (군주제) - 고토바 천황
고토바 천황은 삼종신기 없이 즉위한 최초의 일본 천황으로, 상황으로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지만 조큐의 난 실패 후 유배되었으며, 뛰어난 와카 시인이자 예술가로서 일본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원정 (군주제) - 고시라카와 천황
고시라카와 천황은 토바 천황의 아들로 예상 외로 황위에 올라 다섯 천황의 재위 기간 동안 상황으로서 인세이를 펼치며 호겐의 난과 헤이지의 난, 겐페이 전쟁 등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인물이다. -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문서 - 클릭당 지불
클릭당 지불 광고는 광고주가 광고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온라인 광고 방식으로, 정액제와 입찰 기반 모델이 있으며 검색엔진 결과 페이지 등에 게재되고 키워드 매칭, 광고 품질, 실시간 입찰 등이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며 클릭 사기 등의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인공지능 기반 타겟팅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문서 - 코넬 웨스트
코넬 웨스트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의 철학자, 작가, 사회 활동가, 공공 지식인으로, 진보적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미국의 인종,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ucfirst:{{{1}}}}} 문서 - 클릭당 지불
클릭당 지불 광고는 광고주가 광고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온라인 광고 방식으로, 정액제와 입찰 기반 모델이 있으며 검색엔진 결과 페이지 등에 게재되고 키워드 매칭, 광고 품질, 실시간 입찰 등이 노출 순위에 영향을 미치며 클릭 사기 등의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인공지능 기반 타겟팅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ucfirst:{{{1}}}}} 문서 - 코넬 웨스트
코넬 웨스트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의 철학자, 작가, 사회 활동가, 공공 지식인으로, 진보적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미국의 인종,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 원정 (일본사) | |
|---|---|
| 명칭 | |
| 한국어 명칭 | 원정 |
| 한자 표기 | 院政 |
| 로마자 표기 | insei |
| 영어 명칭 | Cloistered rule |
| 개요 | |
| 정의 | 일본사에서 천황이 생존한 채로 양위한 후, 태상천황으로서 정치를 주도하는 정치 형태이다. |
| 특징 |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면서도, 조정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 역사적 배경 | |
| 시작 | 1086년 시라카와 천황이 아들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한 후 시작되었다. |
| 주요 시기 | 시라카와 천황의 원정 (1086년 ~ 1129년) 도바 천황의 원정 (1129년 ~ 1156년) 고시라카와 천황의 원정 (1158년 ~ 1192년) |
| 종결 | 가마쿠라 막부 성립 이후 천황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점차 쇠퇴하였다. |
| 정치적 구조 | |
| 주도 세력 | 태상천황 (인세이의 주도자) |
| 주요 기관 | 인노고쇼 (院御所) (태상천황의 거처 겸 정치 중심지) 만도코로 (政所) (정무 기관) 구로도도코로 (蔵人所) (비서 기관) 호쿠멘노부시 (北面武士) (경호 무사) |
| 영향 | |
| 긍정적 영향 | 천황가의 재정 기반 강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문화 발전 촉진 |
| 부정적 영향 | 조정의 권위 약화 무사 세력의 성장 정치적 혼란 심화 |
| 원정 시대의 천황 | |
| 주요 천황 | 시라카와 천황 도바 천황 고시라카와 천황 |
| 역할 | 태상천황으로서 실제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였다. |
| 기타 | |
| 관련 사건 | 호겐의 난, 헤이지의 난 등 무사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
2. 등장 전사(前史)
원래 황위는 종신제였으며, 황위 계승은 천황이 붕어해야만 이루어졌다. 고교쿠 천황 이후, 지토 천황, 겐쇼 천황, 쇼무 천황 등은 황위를 양위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황위 계승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위라는 의사 표시로써 마음에 둔 황자에게 황위를 계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고교쿠, 지토, 겐쇼는 여제였으며, 황위 계승자로서 성인 남성 황족이 나타날 때까지의 중간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 쇼무 천황의 경우에는 국가 프로젝트였던 도다이지 건립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사정도 있었다. 이러한 양위는 훗날 원정의 맹아가 된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도 사가 천황, 우다 천황, 엔유 천황 등에게서 양위가 나타난다. 일본의 율령 하에서는 상황은 천황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다소 변칙적인 정체조차 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했다. 이들 천황은 퇴위 후에도 "천황가의 가부장"으로서 젊은 천황을 후견하며 국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이나 재정적·군사적 뒷받침이 불충분했고,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어리고 단명한 천황이 많아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한 상황이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에, 부계에 의한 이 구조는 쇠퇴해 갔다. 대신 모계에 해당하는 천황의 외조부 지위를 차지한 후지와라 북가가 천황의 직무·권리를 대리·대행하는 셋칸 정치가 융성하게 된다.
지랴쿠 4년(1068년), 고산조 천황의 즉위는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헤이안 시대를 통틀어 황위 계승의 안정이 큰 정치 과제로 여겨졌으며, 황통을 이치조 천황 계로 통일한다는 흐름 속에서 고산조 천황이 즉위하게 되었다. 고산조 천황은 우다 천황 이래 후지와라 북가(셋칸케)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170년 만의 천황이었으며, 외척의 지위를 권력의 원천으로 삼았던 셋칸 정치가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
고산조 천황 이전의 천황들 대부분도 즉위 직후 황권 확립과 율령 부흥을 꾀하여 "신정"이라 칭하는 일련의 정책을 기획 실행했지만, 고산조 천황은 외척에 셋칸가를 두지 않은 강점을 배경으로 엔큐의 장원 정리령(1069년) 등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했다. 엔큐 4년(1072년)에 고산조 천황은 제1황자 사다히토 친왕(시라카와 천황)에게 양위했지만, 그 직후에 병사하고 만다.
2. 1. 초기 양위와 섭관 정치
일본에서 임금이 아직 정치를 할 수 있을 때 물러나 다음 임금이 된 어린 아들(또는 손자)의 후견인이 되는 형태는 이미 고대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전왕이 후왕의 정치를 후견한다'는 개념에서 인세이의 뼈대는 이미 지토 천황, 겐메이 천황, 쇼무 천황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무렵에는 아직 일본의 왕위 계승이 안정되지 못했으므로, 천황이 '양위'라는 의사 표시를 통해 자신이 후사로 세우고 싶은 태자에게 왕위를 잇게 하고자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34]일본에서 대왕(오키미)이 양위한 최초의 사례는 고교쿠 천황이며, 헤이안 시대에는 사가 천황, 우다 천황, 엔유 천황 등이 '양위'를 했다. 이렇게 양위한 천황은 퇴위 후에도 '왕가의 최고 웃어른'으로서 어린 천황을 지원하며 국정에 관여하기도 했다.[35] 상황은 정치에 간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고대 일본의 율령은 양위한 천황, 즉 상황을 천황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칙적인 형태마저도 '제도'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직이나 재정적·군사적 뒷받침이 부족했고, 헤이안 중기 이후로는 천황이 어린 나이에 단명하는 경우가 많아, 천황의 아버지이자 왕가의 최고 '웃어른'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젊음과 건강을 제대로 유지한 상황이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부계인 왕가의 힘이 쇠약해진 대신 모계 즉 황후의 아버지로서 왕가의 외척인 후지와라 북가(후지와라 북가의 적통은 후의 섭가로 불림)가 '천황의 외할아버지'로서 천황의 직무와 권리를 대리하고 대행하는 형태의 셋칸 정치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11세기 중엽 고산조 천황이 즉위하면서부터였다. 헤이안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정치 과제는 왕위 계승의 안정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왕위를 이어 받기 위한 왕통이 하나로 단일화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치조 천황 이래 일본 왕실은 (산조 천황을 제외하면) 모두 이치조 천황과 그 아들 사이에서 계승되었는데, 이치조 천황의 손자로서 고산조 천황이 즉위한 시점에서 왕통을 통일하여 이치조 천황 계통으로 단일화한다는 흐름 속에서 지랴쿠 4년(1068년) 즉위한 고산조 천황은 우다 천황 이래 후지와라 북가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170년 만의 임금으로, 이것은 ‘임금의 외척’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이루어져온 셋칸의 정치력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일본에서 고산조 천황 이전에도 왕권의 확립과 율령제의 부활을 꾀하며 이른바 '신정'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한 임금은 많이 있었고, 더욱이 고산조 천황의 경우 외척에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강점까지 더해져서 이를 바탕으로 엔규의 장원 정리령(1069년)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나갔다. 고산조 천황은 재위 4년만인 엔규 4년(1072년)에 제1황자 사다히토 친왕(훗날의 시라카와 천황)에게 양위한 직후 당뇨병으로 사망했는데, 고산조 천황이 사다히토 친왕의 뒤에서 인세이라 불리게 될 그것과 같은 '상왕정치'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가 이미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구칸쇼》나 《신황정통기》에서 제기되고는 있지만, 현대에는 이것이 인세이 자체보다는 고산조 천황 자신의 왕권 강화를 통한 셋칸 정치로의 회귀를 저지하고, 왕위 결정권을 장악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
율령은 퇴위한 천황이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7세기, 8세기 및 9세기에 각각 지토 천황, 쇼무 천황, 우다 천황과 같은 초기 사례가 있다.
10세기 말까지, 후지와라씨의 호케 가문은 관백 직을 통해 일본의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천황은 점점 단순한 허수아비가 되었다. 1068년, 고산조 천황은 호케 가문과 결혼이나 혈연 관계가 없는, 혹은 둘 다 아닌 상태에서 즉위한 거의 200년 만의 첫 번째 천황이 되었다. 그는 후지와라노 요리미치와 그의 형제 후지와라노 노리미치 사이의 내부 갈등을 호케 가문이 처리하는 동안 개인적인 권력을 행사했고, 여러 법률과 규정, 특히 엔큐 장원 규제 칙령을 발행하여 섭정을 약화시키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1072년, 그는 병에 걸려 시라카와 천황에게 양위했다. 그는 이듬해 사망했다. 퇴위 후 권력을 행사할 시간은 없었지만, 산조는 섭정을 약화시키고 인세이의 길을 열었다.
1086년, 시라카와 천황은 네 살이었던 아들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했다. 시라카와의 목표는 왕위 찬탈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의 동생(호리카와의 삼촌)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였지만, 퇴위 후 시라카와는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행사하여 인세이 제도를 가동시켰다.
원래 황위는 소위 종신제였으며, 황위의 계승은 천황의 붕어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고교쿠 천황 이후, 지토 천황·겐쇼 천황·쇼무 천황 등, 황위의 양위가 행해지게 되었다. 당시에는 황위 계승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위라는 의사 표시로써 마음에 둔 황자에게 황위를 계승시키기 위해 취해진 방법으로 생각된다. 고교쿠·지토·겐쇼는 여제였으며, 황위 계승자로서 성인 남성 황족이 나타날 때까지의 중간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다. 쇼무 천황에 관해서는, 국가 프로젝트였던 도다이지 건립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사정도 있었다. 이것들이 후년의 원정의 맹아가 된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서도 사가 천황이나 우다 천황이나, 엔유 천황 등에게도, 양위가 보인다. 일본의 율령 하에서는 상황은 천황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다소 변칙적인 정체조차 제도의 틀 안에서 가능했다. 이러한 천황은 퇴위 후에도 "천황가의 가부장"으로서 젊은 천황을 후견한다고 하여 국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이나 재정적·군사적 뒷받침이 불충분했고, 헤이안 시대 중기에는 어리고 단명한 천황이 많아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한 상황이 끊긴 지 오래였기 때문에, 부계에 의한 이 구조는 쇠퇴해 갔다. 대신 모계에 해당하는 천황의 외조부의 지위를 차지한 후지와라 북가가 천황의 직무·권리를 대리·대행하는 셋칸 정치가 융성하게 된다.
하지만, 지랴쿠 4년(1068년)의 고산조 천황의 즉위는 그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헤이안 시대를 통해 황위 계승의 안정이 큰 정치 과제로 여겨졌으며, 황통을 이치조 천황 계로 통일한다는 흐름 속에서, 고산조 천황이 즉위하게 되었다. 고산조 천황은, 우다 천황 이래 후지와라 북가(셋칸케)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170년 만의 천황이었으며, 외척의 지위를 권력의 원천으로 삼았던 셋칸 정치가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
고산조 천황 이전의 천황의 대부분도 즉위 직후에, 황권의 확립과 율령의 부흥을 꾀하여 "신정"이라고 칭한 일련의 정책을 기획 실행했지만, 고산조 천황은 외척에 셋칸가를 두지 않은 강점도 배경으로, 엔큐의 장원 정리령(1069년) 등의 적극적인 정책 전개를 했다. 엔큐 4년(1072년)에 고산조 천황은 제1 황자 사다히토 친왕(시라카와 천황)에게 양위했지만, 그 직후에 병사하고 만다.
이때, 고산조 천황은 인세이를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가 지엔에 의해 주장된 이후(『구칸쇼』), 기타바타케 지카후사(『진황정통기』), 아라이 하쿠세키 (『도쿠시요론』), 구로이타 가쓰미, 미우라 스에유키 등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와다 히데마쓰가, 재해 이변, 고산조 천황의 병, 사네히토 친왕의 입동궁 3가지가 양위의 이유이며 인세이 시작은 기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히라이즈미 스미가 병으로만 한정하는 등 이견이 나왔다. 최근에는 요시무라 시게키가, 당시의 재해 이변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고산조 천황의 병(당뇨병으로 추정)이 악화된 것이 퇴위 후라는 점을 이유로, 섭관가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사네히토 친왕에게 황위를 계승시킴으로써 황권의 확대를 의도하고, 섭관 정치로의 회귀를 저지한 것이며 인세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통설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카와 게이와 같이, 인세이의 초기의 목적을 황위 결정권의 장악으로 보고, 황권 확대를 의도한 것 자체를 중요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 한편, 최근에는 우다 천황이 다이고 천황에게 양위하여 법황이 된 후에 천황의 병으로 인해 실질적인 인세이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점과, 엔유 천황이 퇴위 후에 아들인 이치조 천황이 황위를 잇자 정무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외조부인 후지와라노 가네이에와 대립했다는 설도 있어, 인세이의 효시를 고산조 천황보다 이전에 보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2. 2. 고산조 천황의 등장과 섭관 정치의 동요
고산조 천황이 즉위하면서 11세기 중엽 일본의 정치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헤이안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정치 과제는 왕위 계승의 안정이었고, 이를 위해 왕통을 하나로 단일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치조 천황 이래 일본 왕실은 (산조 천황을 제외하면) 모두 이치조 천황과 그 아들 사이에서 계승되었는데, 이치조 천황의 손자인 고산조 천황이 즉위한 시점에서 왕통을 통일하여 이치조 천황 계통으로 단일화한다는 흐름이 나타났다. 지랴쿠 4년(1068년) 즉위한 고산조 천황은 우다 천황 이래 후지와라 북가를 외척으로 두지 않은 170년 만의 임금이었다. 이는 ‘임금의 외척’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이루어져 온 셋칸 정치의 정치력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고산조 천황 이전에도 왕권의 확립과 율령제의 부활을 꾀하며 이른바 '신정'(新政)이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한 임금은 많았다. 하지만 고산조 천황은 외척에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강점까지 더해져서 이를 바탕으로 엔큐의 장원 정리령(1069년) 같은 보다 적극적인 개혁 정책을 펼쳐나갔다. 고산조 천황은 재위 4년만인 엔큐 4년(1072년)에 제1황자 사다히토 친왕(훗날의 시라카와 천황)에게 양위한 직후 당뇨병으로 사망했는데, 고산조 천황이 사다히토 친왕의 뒤에서 인세이와 같은 '상왕정치'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견해가 이미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구칸쇼》나 《신황정통기》에서 제기되었지만, 현대에는 이것이 인세이 자체보다는 고산조 천황 자신의 왕권 강화를 통한 셋칸 정치로의 회귀를 저지하고, 왕위 결정권을 장악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34][35]
3. 시라카와 원정과 인세이의 시작
고산조 천황에 이어 시라카와 천황도 셋칸케(摂関家)가 아닌 간인류(閑院流) 출신을 생모로 두었다. 츄나곤(中納言) 후지와라노 기미나리(藤原公成)의 딸이자 춘궁대부(春宮大夫) 후지와라노 요시노부(藤原能信)의 양녀인 뇨고(女御) 시게코(茂子)가 생모였다. 시라카와 천황은 간파쿠를 그대로 둔 채 고산조 천황처럼 친정을 행했다. 1086년(오토쿠 3년)에 불과 여덟 살이었던 친왕 요시히토(善仁,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상천황(太上天皇)이 되었다. 어린 군주의 후견으로서 시라카와인(白河院)이라 칭하며 양위하기 전처럼 정무를 계속 살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인세이의 시작으로 본다.
1097년(조토쿠 3년)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뒤를 이은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의 정치적 경험 부족은 셋칸의 정치력 저하와 셋칸케에 의한 국정 정보 독과점 붕괴를 초래했다. 호리카와 천황은 점차 셋칸 다다자네보다 아버지 시라카와 상황에게 정치를 상담했고, 호리카와 천황 사후 어린 도바 천황이 즉위하면서 시라카와인에 의한 권력 집중이 성립되었다.
인세이를 행하는 상황은 자신의 정무 기관으로서 원청(院庁)[3]을 두고 원선(院宣)·원청하문(院庁下文) 등의 명령 문서를 발급했는데, 근래에는 '비공식 사문서'(비망기)로서의 측면이 있는 상황의 인젠을 통해 인쵸에서 조정에 압력을 가하고, '원의 근신'이라고 불리던 상황의 측근을 태정관에 파견함으로써 실질상 지휘를 맡았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들 '인의 근신'은 상황과의 개인적인 주종 관계에 따라 출세하여 권세를 떨쳤다. 또한 상황 자신의 독자적인 군사 조직으로서 호쿠멘노 부시(北面の武士)를 두는 등, 헤이시 중심의 무사 세력 등용을 도모하여 헤이시의 성장을 재촉했다. 때문에 시라카와 상황에 의한 인세이 실시를 일본 역사의 '중세'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3. 1. 시라카와 원정의 배경과 목적
고산조 천황에 이어 시라카와 천황도 셋칸케(摂関家)가 아닌 간인류(閑院流) 출신을 생모로 두었다. 츄나곤(中納言) 후지와라노 기미나리(藤原公成)의 딸이자 춘궁대부(春宮大夫) 후지와라노 요시노부(藤原能信)의 양녀인 뇨고(女御) 시게코(茂子)가 생모였다. 시라카와 천황은 간파쿠를 그대로 둔 채 고산조 천황처럼 친정을 행했다. 1086년(오토쿠 3년)에 불과 여덟 살이었던 친왕 요시히토(善仁,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상천황(太上天皇)이 되었다. 어린 군주의 후견으로서 시라카와인(白河院)이라 칭하며 양위하기 전처럼 정무를 계속 살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인세이의 시작으로 본다.[11]1107년(가조 2년)에 호리카와 천황이 죽고, 네 살에 불과한 황태자가 즉위하면서(도바 천황) 인세이는 더욱 강화되었다. 시라카와인 이후 인세이를 행했던 상황들은 모두 '치천의 군(治天の君)', 즉 사실상의 군주로서 군림했고, 이 시기 천황은 동궁(황태자)에 불과한 신세로 전락했다.[11]
하지만 시라카와 천황이 처음부터 인세이 체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라카와 천황의 본뜻은 왕위 계승의 안정화(자신의 계통에게 왕위를 독점시키는 것)에 있었다. 동생 사네히토 · 스케히토 친왕 두 친왕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 후보로 존재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아들 요시히토에게 양위함으로써 동생의 왕위 계승(나아가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11]
일본의 사학자 사사키 무네오(佐々木宗雄)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본 구교(公卿)들의 일기에 기록된 조정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라카와 천황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정계의 판단자로서 활약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 '인세이'를 시작했을 때에는 셋칸 후지와라노 모로자네(藤原師実)와 상담해가며 정책을 수행하였고, 호리카와 천황이 관례를 행한 뒤에는 호리카와 천황과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가 협의해 정책을 펼치면서 시라카와 상황과는 상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오랜 기간에 걸친 셋칸 정치의 결과, 국정에 관한 정보가 셋칸에게 집중된 구조로 조정의 구도가 움직였고 따라서 국정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셋칸의 정치력은 제아무리 상황, 천황의 아버지라 해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11]
1099년(조토쿠 3년)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의 갑작스러운 급서로 상황은 급변한다. 모로미치의 뒤를 이은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셋칸의 정치력 저하와 셋칸케에 의한 국정 정보의 독과점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호리카와 천황은 점차 셋칸 다다자네보다 아버지 시라카와 상황에게 정치를 상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다 호리카와 천황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또 다시 어린 군주가 즉위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왕가의 최고 웃어른'''이라고 할 시라카와인에 의한 권력 집중이 성립되기에 이른다.[11]
왕위 계승 형태로서의 부자상속제는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항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왕통이 자칫 단절될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많은 아들이 있다 해도 또 그들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인세이에서는 '치천의 군'이 차기 혹은 그 다음 차기 천황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할 수 있었고, 왕위 계승에 '치천의 군'의 뜻을 반영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외척 관계를 매개로 한 셋쇼, 간파쿠와는 달리 인세이는 '''임금의 친아버지라는 직접적인 부계 혈연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전제적인 통치가 가능했다.[11]
3. 2. '왕가의 웃어른'과 셋칸의 자가당착
고산조 천황과 마찬가지로 시라카와 천황도 셋칸케가 아닌 간인류 출신 뇨고 시게코를 생모로 두었으며, 간파쿠를 그대로 둔 채 친정을 행했다. 시라카와 천황은 오토쿠(應德) 3년(1086년)에 당시 여덟 살이었던 아들 요시히토 친왕(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하고 태상천황이 되었고, 어린 군주의 후견인으로서 시라카와인(白河院)이라 칭하며 양위 전처럼 정무를 계속 살폈다. 이를 인세이의 시작으로 본다.[11]호리카와 천황이 가조(嘉承) 2년(1107년)에 죽고 네 살의 황태자가 도바 천황으로 즉위하면서 인세이는 더욱 강화되었다. 시라카와인 이후 인세이를 행했던 상황들은 모두 '치천의 군', 즉 사실상의 군주로 군림했고, 이 시기 천황은 황태자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하지만 시라카와 천황이 처음부터 인세이 체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라카와 천황의 본뜻은 왕위 계승의 안정화, 즉 자신의 계통에게 왕위를 독점시키는 것에 있었다. 동생 사네히토 · 스케히토 두 친왕이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들 요시히토에게 양위함으로써 동생의 왕위 계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일본 사학자 사사키 무네오(佐々木宗雄)의 연구에 따르면, 시라카와 천황은 처음 인세이를 시작했을 때 셋칸 후지와라노 모로자네(藤原師実)와 상담하며 정책을 수행했고, 호리카와 천황이 관례를 치른 뒤에는 호리카와 천황과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가 협의해 정책을 펼치면서 시라카와 상황과는 상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당시 오랜 셋칸 정치로 국정 정보가 셋칸에게 집중되어, 상황이나 천황의 아버지라도 셋칸의 정치력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토쿠(承徳) 3년(1099년)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가 급사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모로미치의 뒤를 이은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는 정치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셋칸의 정치력 저하와 셋칸케에 의한 국정 정보 독과점 붕괴를 초래했다. 호리카와 천황은 점차 셋칸 다다자네보다 아버지 시라카와 상황에게 정치를 상담하게 된다. 게다가 호리카와 천황마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어린 군주가 즉위하면서 '''일본 왕가의 최고 웃어른'''인 시라카와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왕위 계승 형태로서의 부자상속제는 왕통 단절의 위험이 있었고, 많은 아들이 있으면 왕위 계승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인세이에서는 '치천의 군'이 차기 혹은 그 다음 차기 천황을 지명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할 수 있었고, 왕위 계승에 '치천의 군'의 뜻을 반영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외척 관계를 매개로 한 셋쇼, 간파쿠와는 달리 인세이는 '''임금의 친아버지라는 직접적인 부계 혈연에 근거'''했기에 전제적인 통치가 가능했다.
한편 일본의 사학자 히구치 겐타로(樋口健太郎)는 시라카와 인세이의 전제로서 당시 황태후 조토몬인(上東門院) 쇼시(彰子, 후지와라노 아키코)의 존재를 지적한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딸로 입궐, 이치조 천황의 황후가 되어 고이치조 천황(後一條天皇)과 고스자쿠 천황(後朱雀天皇)을 낳은 조토몬인은 고스자쿠-고레이제이-고산조-시라카와까지 5대에 걸치는 천황의 조정에서 '웃어른'과 같은 존재, 즉 일본 왕실의 '대왕대비'로 군림했다.
셋쇼(攝政)는 천황의 칙허만으로 임명되기 어려웠다. 후지와라노 미치나가·요리미치(頼通) 부자가 셋쇼로서 정치를 보좌했던 이치조 천황과 고이치조 천황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판단력이 미숙했기에, 셋쇼 자신이 군주인 천황의 의사를 제치고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는 모순이 지적될 수 있었다. 결국 미치나가·요리미치 부자의 셋쇼 임명은 '''일본 왕가의 웃어른'''이었던 '대왕대비' 조토몬인의 영지를 받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조토몬인 쇼시가 쇼호(承保) 원년(1074년)에 세상을 떠난 후, 후지와라노 모로자네는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고자 왕가의 웃어른이라 할 수 있는 ''''태상왕'''' 시라카와 상황에게 셋칸 임명에 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신이 셋칸으로서 임금의 정치를 보좌하는(섭정) 자격을 임명하고 승인해 줄 '왕가의 웃어른'이라는 권위를 기존의 대왕대비에서 태상왕에게 구한 것'''이다.
셋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 그 권위를 승인하고 보증해 줄 '왕가의 웃어른'으로 시라카와 상황을 선택한 것은 모로자네에게도 필수적이었다. 시라카와 상황도 자신의 직속 기관인 인쵸(院廳)의 인사권을 모로자네에게 일임하는 등 모로자네를 국정 주도자로 인정했다.
이는 셋칸의 권위 유지를 위한 전략적인 띄워주기였다. 조정의 정치력이 모두 셋칸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상황은 '왕가의 웃어른'으로서 차기 천황 지명 권리를 제외하고 셋칸의 필요에 따라 셋칸을 '신임 천황을 보좌하여 국정을 대행하는 자'로 지명하고 그 권위를 보증해 주는 존재 그 이상의 정치 권력을 휘두르기 어려웠다. 셋칸 역시 자신을 '천황의 대행자'로 승인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권위만을 상황에게 요구했고, 동시에 그러한 셋칸의 지위를 승인할 정도의 권위자로서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 '왕가의 웃어른'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게끔 지원했다.
그런데 호리카와 천황의 셋칸이 된 모로자네는 간지(寛治) 8년(1094년) 자신의 아들 모로미치에게 간파쿠(関白)를 맡게 했는데, 모로미치가 조토쿠(承徳) 3년(1099년) 36세로 급서하고, 은퇴 상태였던 모로자네도 2년 뒤에 세상을 떠난다. 모로자네가 셋칸의 권위를 지키고자 고의로 떠받들었던 시라카와 상황(법황)의 권위, 조토몬인의 선례를 근거로 한 '왕가의 웃어른' 시라카와 상황(법황)의 셋칸 임명에 관한 인사권 관여, 이런 모든 장치들이 결과적으로 후지와라노 다다자네의 셋쇼 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치천의 군'의 셋칸 임명권을 정당화시켜 버렸다. 그전까지 셋칸이 필요에 따라 상황의 ‘명의’만 빌려 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일변하여 이제는 셋칸의 존재와 임명 그 자체를 말 그대로 상황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인세이의 전개와 특징

고산조 천황과 마찬가지로 시라카와 천황도 생모가 셋칸 가문이 아닌 간인류(閑院流) 출신이었다. 츄나곤 후지와라노 기미나리(藤原公成)의 딸이자 춘궁대부 후지와라노 요시노부(藤原能信)의 양녀인 뇨고(女御) 시게코(茂子)가 시라카와 천황의 생모였다. 시라카와 천황은 간파쿠를 그대로 둔 채 고산조 천황처럼 친정을 행했다. 오토쿠(應德) 3년(1086년)에 당시 여덟 살에 불과했던 친왕 요시히토(善仁,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상천황(太上天皇)이 되었는데, 어린 군주의 후견으로서 시라카와인(白河院)이라 칭하며 양위하기 전처럼 계속 정무를 살폈다.
가조(嘉承) 2년(1107년)에 호리카와 천황이 죽고, 네 살에 불과한 황태자가 즉위하면서(도바 천황) 인세이는 강화되었다. 시라카와인 이후 인세이를 행했던 상황들은 모두 '치천의 군'으로 불리며 사실상 군주로 군림했다.
시라카와 천황은 왕위 계승을 안정화하고 자신의 계통에게 왕위를 독점시키고자 했다. 동생 사네히토 · 스케히토 두 친왕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 후보였기에, 자신의 아들 요시히토에게 양위함으로써 동생들의 왕위 계승을 견제하려 했다.
일본 사학자 사사키 무네오(佐々木宗雄)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인세이'를 시작했을 때에는 셋칸 후지와라노 모로자네(藤原師実)와 상담하며 정책을 수행했고, 호리카와 천황이 관례를 행한 뒤에는 호리카와 천황과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가 협의해 정책을 펼치면서 시라카와 상황과는 상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오랜 셋칸 정치로 국정에 관한 정보가 셋칸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조토쿠(承徳) 3년(1099년)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의 급서로 상황은 급변했다. 뒤를 이은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셋칸의 정치력 저하를 가져왔다. 호리카와 천황은 점차 아버지 시라카와 상황에게 정치를 상담하게 되었고, 호리카와 천황마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시라카와인에 의한 권력 집중이 성립되었다.
인세이에서는 '치천의 군'이 차기 혹은 그 다음 차기 천황을 지명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된 왕위 계승이 가능했고, 왕위 계승에 '치천의 군'의 뜻을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외척 관계를 매개로 한 셋쇼, 간파쿠와는 달리 인세이는 임금의 친아버지라는 직접적인 부계 혈연에 근거했기에 전제적인 통치가 가능했다.
4. 1. 인세이의 구조와 기능
고산조 천황과 마찬가지로 시라카와 천황도 생모가 셋칸 가문이 아닌 간인류(閑院流) 출신이었다. 츄나곤 후지와라노 기미나리(藤原公成)의 딸이자 춘궁대부 후지와라노 요시노부(藤原能信)의 양녀인 뇨고(女御) 시게코(茂子)가 시라카와 천황의 생모였다. 시라카와 천황은 간파쿠를 그대로 둔 채 고산조 천황처럼 친정을 행했다. 오토쿠(應德) 3년(1086년)에 당시 여덟 살에 불과했던 친왕 요시히토(善仁,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상천황(太上天皇)이 되었는데, 어린 군주의 후견으로서 시라카와인(白河院)이라 칭하며 양위하기 전처럼 계속 정무를 살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인세이의 시작으로 본다.[8]호리카와 천황은 가조(嘉承) 2년(1107년)에 죽고, 네 살에 불과한 황태자가 즉위하면서(도바 천황)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천황의 독자성이 있었던 호리카와 천황 때보다 더 확실하게 인세이가 강화되었다. 시라카와인 이후 인세이를 행했던 상황들은 모두 '치천의 군', 즉 사실상의 군주로서 군림했고 이 시기 천황은 동궁(황태자)에 불과한 신세로 전락했다.[8]
다만 시라카와 천황이 당초부터 일본 학계 및 대중에 알려진 것과 같은 인세이 체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흐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라카와 천황의 본뜻은 왕위 계승의 안정화(자신의 계통에게 왕위를 독점시키는 것)에 있었다. 동생 사네히토 · 스케히토 두 친왕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 후보로 존재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아들 요시히토에게 양위함으로써 동생의 왕위 계승(나아가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8]
일본의 사학자 사사키 무네오(佐々木宗雄)의 연구에 따르면 《츄유키》(中右記) 같은 당시 일본 구교들의 일기에 기록된 조정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라카와 천황이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정계의 판단자로서 활약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처음 '인세이'를 시작했을 때에는 셋칸 후지와라노 모로자네(藤原師実)와 상담해가며 정책을 수행하였고, 호리카와 천황이 관례를 행한 뒤에는 호리카와 천황과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가 협의해 정책을 펼치면서 시라카와 상황과는 상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당시 오랜 기간에 걸친 셋칸 정치의 결과, 국정에 관한 정보가 셋칸에게 집중된 구조로 조정의 구도가 움직였고 따라서 국정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셋칸의 정치력은 제아무리 상황, 천황의 아버지라 해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8]
조토쿠(承徳) 3년(1099년)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의 급서로 상황은 급변한다. 모로미치의 뒤를 이은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셋칸의 정치력 저하와 셋칸케에 의한 국정 정보의 독과점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호리카와 천황은 점차 셋칸 다다자네보다 아버지 시라카와 상황에게 정치를 상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다 호리카와 천황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또 다시 어린 군주가 즉위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왕가의 최고 웃어른'''이라고 할 시라카와인에 의한 권력 집중이 성립되기에 이른다.[8]
왕위 계승 형태로서의 부자상속제는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항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왕통이 자칫 단절될 위험이 있었고, 반대로 많은 아들이 있다 해도 또 그들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인세이에서는 '치천의 군'이 차기 혹은 그 다음 차기 천황을 지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할 수 있었고, 왕위 계승에 '치천의 군'의 뜻을 반영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외척 관계를 매개로 한 셋쇼, 간파쿠와는 달리 인세이는 '''임금의 친아버지라는 직접적인 부계 혈연에 근거'''한 것이었기에 전제적인 통치가 가능했다.[8]
인세이를 행하는 상황은 자기의 정무 기관으로서 인쵸를 두고 인젠(院宣)·인쵸쿠다시부미(院廳下文) 등의 명령문서를 발급했는데, 기존의 일본 학계에서는 인쵸에서 조정의 모든 실제 정무가 이관되다시피 하여 이루어졌다고 여겨졌지만 근래에는 '비공식 사문서'(비망기)로서의 측면이 있는 상황의 인젠을 통해 인쵸에서 조정에 압력을 가하고, '인의 근신(近臣)'이라고 불리던 상황의 측근을 태정관에 파견함으로써 실질상 지휘를 맡았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이들 '인의 근신'은 상황과의 개인적인 주종 관계에 따라 출세하여 권세를 떨쳤다. 또한 상황 자신의 독자적인 군사 조직으로서 '북면의 무사'를 두는 등, 헤이시 중심의 무사 세력 등용을 도모하여 헤이시의 성장을 재촉했다. 때문에 시라카와 상황에 의한 인세이 실시를 일본 역사의 '중세'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8]
4. 2. 인세이의 특징과 왕위 계승
고산조 천황과 마찬가지로 시라카와 천황도 셋칸케가 아닌 간인류(閑院流) 출신 뇨고(女御) 시게코(茂子)를 생모로 두었으며, 간파쿠를 그대로 둔 채 친정을 행했다. 시라카와 천황은 1086년에 당시 여덟 살이었던 아들 요시히토(善仁,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하고 태상천황(太上天皇)이 되었는데, 어린 천황의 후견인으로서 시라카와인(白河院)이라 칭하며 양위 전처럼 정무를 계속 보았다. 이를 일반적으로 인세이의 시작으로 본다.1107년 호리카와 천황이 죽고 네 살에 불과한 황태자가 도바 천황으로 즉위하면서, 인세이는 더욱 강화되었다. 시라카와인 이후 인세이를 행했던 상황들은 모두 '치천의 군', 즉 사실상의 군주로 군림했고, 이 시기 천황은 동궁(황태자)과 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시라카와 천황은 당초부터 인세이 체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왕위 계승의 안정화(자신의 계통에게 왕위를 독점시키는 것)를 꾀했다. 동생 사네히토 · 스케히토 두 친왕이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로 존재하던 상황에서, 아들 요시히토에게 양위함으로써 동생의 왕위 계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일본 사학자 사사키 무네오(佐々木宗雄)의 연구에 따르면, 시라카와 천황은 처음 인세이를 시작했을 때 셋칸 후지와라노 모로자네(藤原師実)와 상담하며 정책을 수행했고, 호리카와 천황이 관례를 행한 뒤에는 호리카와 천황과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가 협의해 정책을 펼치면서 시라카와 상황과는 상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당시 오랜 셋칸 정치로 인해 국정 정보가 셋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99년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가 급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뒤를 이은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는 정치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셋칸의 정치력 저하와 국정 정보 독과점 붕괴를 초래했다. 호리카와 천황은 점차 아버지 시라카와 상황에게 정치를 상담하게 되었고, 호리카와 천황마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결과적으로 시라카와인에 의한 권력 집중이 성립되었다.
왕위 계승 형태로서의 부자상속제는 왕위를 이을 아들을 항상 확보할 수 없어 왕통이 단절될 위험이 있었고, 많은 아들이 있을 경우 왕위 계승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인세이에서는 '치천의 군'이 차기 혹은 그 다음 차기 천황을 지명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할 수 있었고, 왕위 계승에 '치천의 군'의 뜻을 반영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외척 관계를 매개로 한 셋쇼, 간파쿠와는 달리 인세이는 '''임금의 친아버지라는 직접적인 부계 혈연에 근거'''했기에 전제적인 통치가 가능했다.[3]
4. 3. 인세이와 재정
고산조 천황과 마찬가지로 시라카와 천황도 생모가 셋칸케가 아닌 간인류(閑院流) 출신이었다. 츄나곤 후지와라노 기미나리(藤原公成)의 딸이자 춘궁대부 후지와라노 요시노부(藤原能信)의 양녀인 뇨고(女御) 시게코(茂子)가 시라카와 천황의 생모였는데, 시라카와 천황은 간파쿠를 그대로 둔 채 고산조 천황처럼 친정을 행했다. 오토쿠 3년(1086년)에 당시 여덟 살에 불과했던 친왕 요시히토(善仁, 호리카와 천황)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태상천황(太上天皇)이 되었다. 어린 군주의 후견으로서 시라카와인(白河院)이라 칭하며 양위하기 전처럼 계속 정무를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인세이의 시작으로 본다.가조 2년(1107년) 호리카와 천황이 죽고 네 살에 불과한 황태자가 즉위하면서(도바 천황) 인세이는 더욱 강화되었다. 호리카와 천황 시기에는 천황의 독자성이 어느 정도 정책 수립 및 결정에 반영되었지만, 도바 천황 시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약화되었다. 시라카와인 이후 인세이를 행했던 상황들은 모두 '치천의 군', 즉 사실상의 군주로서 군림했고, 이 시기 천황은 동궁(황태자)에 불과한 신세로 전락했다.
다만 시라카와 천황이 처음부터 인세이 체제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흘러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라카와 천황의 본뜻은 왕위 계승의 안정화(자신의 계통에게 왕위를 독점시키는 것)에 있었다. 동생 사네히토 · 스케히토 두 친왕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 후보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요시히토에게 양위함으로써 동생의 왕위 계승(및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일본 사학자 사사키 무네오(佐々木宗雄)의 연구에 따르면, 《츄유키》(中右記) 등 당시 일본 구교들의 일기에 기록된 조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라카와 천황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정계의 판단자로서 활약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 '인세이'를 시작했을 때에는 셋칸 후지와라노 모로자네(藤原師実)와 상담하며 정책을 수행했고, 호리카와 천황이 관례를 행한 뒤에는 호리카와 천황과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藤原師通)가 협의해 정책을 펼치면서 시라카와 상황과는 상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오랜 셋칸 정치의 결과로 국정에 관한 정보가 셋칸에게 집중되었고, 국정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셋칸의 정치력은 상황이나 천황의 아버지라 해도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조토쿠 3년(1099년) 간파쿠 후지와라노 모로미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모로미치의 뒤를 이은 후지와라노 다다자네(藤原忠実)는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고, 이는 셋칸의 정치력 저하와 셋칸케에 의한 국정 정보 독과점 붕괴를 초래했다. 호리카와 천황은 점차 셋칸 다다자네보다 아버지 시라카와 상황에게 정치를 상담하게 된다. 게다가 호리카와 천황마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또다시 어린 군주가 즉위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왕가의 최고 웃어른'''인 시라카와인에 의한 권력 집중이 성립되었다.
부자상속제는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왕통이 단절될 위험이 있었다. 반대로 많은 아들이 있다면 그들 사이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인세이에서는 '치천의 군'이 차기 혹은 그다음 차기 천황을 지명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된 왕위 계승을 실현할 수 있었고, 왕위 계승에 '치천의 군'의 뜻을 반영시킬 수도 있었다. 또한 외척 관계를 매개로 한 셋쇼, 간파쿠와는 달리 인세이는 '''임금의 친아버지라는 직접적인 부계 혈연에 근거'''했기에 전제적인 통치가 가능했다.
인세이를 행하는 상황은 자신의 정무 기관으로서 인쵸를 두고 인젠(院宣)·인쵸쿠다시부미(院廳下文) 등의 명령문서를 발급했다. 기존의 일본 학계에서는 인쵸에서 조정의 모든 실제 정무가 이관되다시피 이루어졌다고 여겨졌지만, 근래에는 상황의 인젠을 통해 인쵸에서 조정에 압력을 가하고, '인의 근신(近臣)'이라 불리던 상황의 측근을 태정관에 파견함으로써 실질상 지휘를 맡았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인의 근신'은 상황과의 개인적인 주종 관계에 따라 출세하여 권세를 떨쳤다. 상황은 독자적인 군사 조직으로서 '북면의 무사'를 두는 등, 헤이시 중심의 무사 세력 등용을 도모하여 헤이시의 성장을 재촉했다. 때문에 시라카와 상황에 의한 인세이 실시를 일본 역사의 '중세'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5. 인세이의 최전성기와 쇠퇴
조큐의 난 이후 인세이는 구게 정권의 중추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 특히 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인세이를 펼친 고사가인 때에 인세이의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다. 고사가인은 주사(벤칸이나 구로도에 의한 상주)를 중개하는 직책인 덴소를 제도화하고, 인이 가마쿠라 막부의 효조슈와 함께 상론(소송) 재결에 해당하는 인노효조를 확립하여 원정의 기능 강화에 힘썼다.[19][20]
고사가인 이후 지묘인 왕통과 다이카쿠지 왕통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던 시대에는 실제 원정을 행하는 '치천의 군'이 천황의 아버지(혹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여야 할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지묘인 왕통의 후시미 천황이 즉위했을 때 그의 친아버지 고후카쿠사인이 인세이를 실시하면서, 후시미 천황의 전임 천황인 다이카쿠지 왕통의 고우다 상황이 이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고우다인의 아들인 고니조 천황이 즉위했을 때에는 후시미 상황이 아닌 고니조 천황의 아버지 고우다인이 인세이를 행했다. 이때 후시미 상황의 태자로서 고후시미인의 동생인 후쿠히토 친왕(훗날의 하나조노 천황)이 태자로 세워졌는데, 그는 고후시미인의 유자로 여겨졌다(《황년대략기》, 《신황정통기》 등). 하나조노 천황이 즉위한 뒤에는 후시미인이 원정을 행하다가 쇼와 2년(1313년) 10월 17일에 '치천의 군' 지위가 고후시미인에게 양보되었고(《일대요기》), 4년 뒤 후시미인이 사망했을 때에도 하나조노 천황은 친아버지의 장례를 할아버지의 예로 치렀다(《마스카가미》). 이는 본래 하나조노 천황의 형인 고후시미인이 '치천의 군' 자격을 얻기 위해 하나조노 천황과 유자 관계를 맺었으므로, 본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후시미인과 하나조노 천황의 관계도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묘인 왕통의 사례이고, 다이카쿠지 왕통의 사례는 확실하지 않다. 이후 지묘인 왕통에서는 치천의 군으로 예정된 사람과 왕위 계승 예정자 사이에 '숙부-조카' 관계가 맺어져 '치천의 군'과 천황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의제되게 되었다(고코 천황과 고묘 천황 및 나오히토 친왕,[21] 고코마쓰인과 고하나조노 천황).
겐무 신정 시기에는 고다이고 천황이 친정을 실시하면서 인세이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수년 만에 북조에 의한 인세이가 부활하여 무로마치 시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에이쿄 5년(1433년) 고코마쓰인이 사망하면서 인세이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이후로도 상황이 천황을 후견하는 형태가 등장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했다.
5. 1. 시라카와인 이후의 인세이
시라카와인이 도바 천황에게 양위하고 그의 첫째 아들인 스토쿠 천황을 천황으로 세운 뒤 사망하면서, 시라카와인에 이어 인세이를 하게 된 도바 상황은 스토쿠 천황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18] 도바 상황은 스토쿠 천황의 아들 시게히토 친왕 대신 자신의 총애하는 비(妃) 비후쿠몬인 소생 나리히토 친왕(고노에 천황)에게 왕위를 잇게 했다. 고노에 천황이 사망한 후에는 다이켄몬인 소생이자 스토쿠 천황의 동생인 마사히토 친왕을 지명하여 태자 책봉도 거치지 않고 고시라카와 천황으로 즉위시켰다. 호겐 원년(1156년) 도바 상황이 사망하자, 스토쿠 상황 지지파와 고시라카와 천황 지지파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여기서 고시라카와 천황이 승리했다(호겐의 난).고시라카와 천황은 호겐 3년(1158년) 아들 니조 천황에게 양위하고 인세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천황인 나야말로 정통'이라는 의식이 강했던[36] 니조 천황은 부왕이 주도하는 인세이가 아니라 천황 자신의 친정을 지향했다. 이로 인해 조정은 다시 고시라카와 상황 지지파와 니조 천황 지지파로 나뉘었다. 니조 천황 대의 고시라카와 상황의 인세이는 강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니조 천황이 에이만 원년(1165년) 6월 25일에 병을 이유로 어린 로쿠조 천황에게 양위하고 불과 한 달 뒤인 7월 28일에 세상을 떠나면서 고시라카와인의 인세이는 비로소 강화되었다.
이후 헤이지의 난과 다이라노 기요모리를 필두로 하는 헤이케 정권의 등장 및 붕괴, 지쇼 · 주에이 연간의 내란인 겐페이 전쟁의 발발, 그리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가마쿠라 막부 성립 등 무사들이 잇따라 대두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런 와중에 고시라카와 법황은 말년에 헤이케의 수장인 다이라노 기요모리와 대립하다 지쇼 3년(1179년) 11월의 정변으로 도바도노에 유폐되어 인세이가 중단되고 만다(지쇼 3년의 정변). 고시라카와 법황의 원정이 중단되면서 다카쿠라 천황의 친정 체제가 성립되었지만, 다카쿠라 천황도 이듬해 지쇼 4년(1180년) 2월에 안토쿠 천황에게 양위하고 다시 다카쿠라 상황의 인세이가 시작되었다. 다카쿠라 상황이 인세이를 행하던 동안 후쿠하라 천도 등이 이루어졌지만, 병약했던 다카쿠라 상황이 후쿠하라에서 병을 얻어 교토로 돌아온 직후(1181년) 사망하고, 얼마 안 가서 헤이케의 수장 다이라노 기요모리도 죽었다. 기요모리 사후 헤이케의 수장이 된 다이라노 무네모리는 고시라카와 법황의 인세이를 부활시켰다. 이후 헤이케는 겐지의 공세에 쫓겨 교토를 떠나 서쪽으로 밀려갔고, 최종적으로 단노우라 전투의 패배로 일족이 멸망하였다.
고시라카와 법황의 뒤를 이어 인세이를 행했던 손자 고토바 상황은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의 암살을 호기로 삼아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 조정 권력의 부흥을 꾀했지만 실패했고(조큐의 난), 오히려 상황 자신마저 오키로 유배되고 조정 권력의 저하 및 싯켄 호조 집안의 정치 개입을 초래했다. 조큐의 난 이후 즉위한 고호리카와 천황의 아버지 모리사다 친왕가 예외적으로 즉위는 고사하고 태자 책봉도 거친 적이 없이 당시에는 아예 승려로 출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상천황 존호를 받고 인세이를 행하는(고다카쿠라인) 해괴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조큐의 난 이후 인세이는 구게 정권의 중추로 그 역할을 다했다. 특히 조큐의 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인세이를 행하게 된 고사가인 때에 인세이의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고사가인은 주사(벤칸이나 구로도에 의한 상주)를 전하는 직무인 덴소를 제도화하고, 인이 가마쿠라 막부의 효조슈와 같이 상론(소송)에 관여하는 인노효조를 확립하는 등 원정의 기능 강화에 애썼다.
고사가인 이후 지묘인 왕통과 다이카쿠지 왕통이 서로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시대에는 실제 원정을 행하는 '치천의 군'이 천황의 아버지(혹은 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여야 할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지묘인 왕통의 후시미 천황이 즉위했을 때 그의 친아버지 고후카쿠사인이 인세이를 실시하면서 후시미 천황의 전임 천황인 다이카쿠지 왕통의 고우다 상황이 이를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고우다인의 아들인 고니조 천황이 즉위했을 때에는 후시미 상황이 아닌 고니조 천황의 아버지 고우다인이 인세이를 행했다. 덧붙여 이때 후시미 상황의 태자로서 고후시미인의 동생인 후쿠히토 친왕(훗날의 하나조노 천황)이 태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고후시미인의 유자로 여겨졌다(《황년대략기》 · 《신황정통기》등). 하나조노 천황이 즉위한 뒤에는 후시미인이 원정을 행했다가 쇼와 2년(1313년) 10월 17일에 '치천의 군'의 지위가 고후시미인에 양보되어(《일대요기》), 4년 뒤에 후시미인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조노 천황은 친아버지의 장례를 할아버지의 예로 치렀다(《마스카가미》). 이는 본래는 하나조노 천황의 형인 고후시미인이 '치천의 군'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하나조노 천황과 유자 관계를 맺었으므로 본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후시미인과 하나조노 천황의 관계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묘인 왕통의 사례이고, 다이카쿠지 왕통의 사례는 확실하지 않다. 이후의 지묘인 왕통에서는 치천의 군으로 예정된 사람과 왕위 계승 예정자 사이에 '숙부-조카' 관계가 맺어져 '치천의 군'과 천황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의제되게 되었다(고코 천황과 고묘 천황 및 나오히토 친왕, 고코마쓰인과 고하나조노 천황).
겐무 신정 시기에는 고다이고 천황이 친정을 실시하면서 인세이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수 년 만에 북조에 의한 인세이가 부활하고 이는 무로마치 시대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에이쿄 5년(1433년) 고코마쓰인이 사망하면서 인세이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이후로도 상황이 천황을 후견하는 형태가 등장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존재에 불과했다.
5. 2. 고시라카와 법황과 헤이케의 몰락
고시라카와 천황은 호겐 3년(1158년)에 아들 니조 천황에게 양위하고 인세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천황인 나야말로 정통'이라는 의식이 강했던[36] 니조 천황이 부왕이 주도하는 인세이가 아니라 임금 자신의 친정(親政)을 지향하면서 조정은 고시라카와 상황 지지파와 니조 천황 지지파로 나뉘었다. 니조 천황 대의 고시라카와 상황의 인세이는 그리 강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니조 천황이 에이만(永万) 원년(1165년) 6월 25일에 병을 이유로 나이 어린 로쿠조 천황에게 양위하고 불과 한 달 뒤인 7월 28일에 세상을 떠나면서 고시라카와인의 인세이는 비로소 강화되었다.이후 헤이지의 난과 다이라노 기요모리를 필두로 하는 헤이케 정권의 등장 및 붕괴, 지쇼 · 주에이 연간의 내란 (겐페이 전쟁)의 발발, 그리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가마쿠라 막부 성립 등 무사들이 잇따라 대두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 이런 와중에 고시라카와 법황은 말년에 헤이케의 수장인 다이라노 기요모리와 대립하다가 지쇼 3년(1179년) 11월의 정변으로 이궁(離宮) 도바도노(鳥羽殿)에 유폐되어 그의 인세이는 중단되고 만다(지쇼 3년의 정변). 고시라카와 법황의 원정 중단으로 다카쿠라 천황의 친정 체제가 성립되었지만, 다카쿠라 천황도 이듬해 지쇼 4년(1180년) 2월에 안토쿠 천황에게 양위하고 다시 다카쿠라 상황의 인세이가 시작되었다. 다카쿠라 상황이 인세이를 행하던 동안 후쿠하라쿄(福原) 천도 등이 이루어졌지만, 병약했던 다카쿠라 상황이 후쿠하라에서 병을 얻어 교토로 돌아온 직후(1181년) 사망하고, 얼마 안 가서 헤이케의 도료(수장) 다이라노 기요모리도 죽었다. 기요모리 사후 헤이케의 도료가 된 다이라노 무네모리는 고시라카와 법황의 인세이를 부활시켰다. 이후 헤이케는 겐지의 공세에 쫓겨 교토를 떠나 서쪽으로 밀려갔고, 최종적으로 단노우라 전투의 패배로 멸망하였다.
고시라카와 법황의 뒤를 이어 인세이를 행했던 손자 고토바 상황은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의 암살을 호기로 삼아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 조정 권력의 부흥을 꾀했지만 실패했고(조큐의 난), 오히려 상황 자신마저 오키로 유배되고 조정 권력의 저하 및 싯켄(執權) 호조(北條) 집안의 정치 개입을 초래했다. 조큐의 난 이후 즉위한 고호리카와 천황의 아버지가 예외적으로 즉위는 고사하고 태자 책봉도 거친 적이 없이 당시에는 아예 승려로 출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상천황 존호를 받고 인세이를 행하는(고다카쿠라인) 사태까지 발생했다.
5. 3. 조큐의 난과 인세이의 변화
고토바 상황은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 암살을 계기로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 조정 권력 부흥을 꾀했으나 실패했다(조큐의 난).[36] 이로 인해 상황 자신마저 오키로 유배되었고, 조정 권력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싯켄(執權) 호조 집안의 정치 개입을 초래했다. 조큐의 난 이후 즉위한 고호리카와 천황의 아버지 모리사다 친왕이 예외적으로 즉위는 물론 태자 책봉도 거치지 않은 채 승려로 출가한 상태였음에도 태상천황 존호를 받고 인세이를 행하는(고다카쿠라인) 이례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다.
5. 4. 양통迭립기와 인세이
시라카와 상황은 도바 천황을 양위시키고 그의 제1황자(스토쿠 천황)를 천황으로 삼은 뒤에 사망했는데, 시라카와인 다음으로 인세이를 행하게 된 도바 상황은 스토쿠 천황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스토쿠 천황의 황자 시게히토 친왕 대신 자신의 총비 비후쿠몬인(美福門院) 소생 나리히토 친왕(고노에 천황)에게 왕위를 잇게 했다.[18]고노에 천황 사후에는 정비 다이켄몬인(待賢門院) 소생으로 스토쿠 천황의 다른 동생인 마사히토 친왕을 지명하여 태자 책봉도 거치지 않은 채 고시라카와 천황(後白河天皇)으로 즉위하게 하였다. 도바 상황은 호겐(保元) 원년(1156년) 사망하고, 스토쿠 상황 지지파와 고시라카와 천황 지지파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호겐의 난)에서 고시라카와 천황은 승리를 거두었다.고시라카와 천황은 호겐 3년(1158년)에 아들 니조 천황(二条天皇)에게 양위하고 인세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천황인 나야말로 정통'이라는 의식이 강했던[36] 니조 천황이 부왕이 주도하는 인세이가 아니라 임금 자신의 친정(親政)을 지향하면서 또 한 번 조정은 고시라카와 상황 지지파와 니조 천황 지지파로 나뉘었다. 니조 천황대의 고시라카와 상황의 인세이는 그리 강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니조 천황이 에이만(永万) 원년(1165년) 6월 25일에 병을 이유로 나이 어린 로쿠조 천황(六条天皇)에게 양위하고 불과 한 달 뒤인 7월 28일에 세상을 떠나면서 고시라카와인의 인세이는 비로소 강화되었다.
이후 헤이지의 난과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淸盛)를 필두로 하는 헤이케 정권의 등장 및 붕괴, 지쇼 · 주에이 연간의 내란(겐페이 전쟁)의 발발, 그리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가마쿠라 막부 성립 등 무사들이 잇따라 대두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다. 이런 와중에 고시라카와 법황은 말년에 헤이케의 수장인 다이라노 기요모리와 대립하다가 지쇼 3년(1179년) 11월의 정변으로 이궁(離宮) 도바도노(鳥羽殿)에 유폐되어 그의 인세이는 중단되고 만다(지쇼 3년의 정변). 고시라카와 법황의 원정이 중단되면서 다카쿠라 천황의 친정 체제가 성립되었지만, 다카쿠라 천황도 이듬해 지쇼 4년(1180년) 2월에 안토쿠 천황에게 양위하고 다시 다카쿠라 상황의 인세이가 시작되었다. 다카쿠라 상황이 인세이를 행하던 동안 후쿠하라 천도 등이 이루어졌지만, 병약했던 다카쿠라 상황이 후쿠하라에서 병을 얻어 교토로 돌아온 직후(1181년) 사망하고, 얼마 안 가서 헤이케의 도료(수장) 다이라노 기요모리도 죽었다. 기요모리 사후 헤이케의 도료가 된 다이라노 무네모리는 고시라카와 법황의 인세이를 부활시켰다. 이후 헤이케는 겐지의 공세에 쫓겨 교토를 떠나 서쪽으로 밀려갔고, 최종적으로 단노우라 전투의 패배로 일족이 멸망하였다.
고시라카와 법황의 뒤를 이어 인세이를 행했던 손자 고토바 상황은 당시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의 암살을 호기로 삼아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고 조정 권력의 부흥을 꾀했지만 실패했고(조큐의 난), 오히려 상황 자신마저 오키로 유배되고 조정 권력의 저하 및 싯켄(執權) 호조(北條) 집안의 정치 개입을 초래했다. 조큐의 난 이후 즉위한 고호리카와 천황의 아버지가 예외적으로 즉위는 고사하고 태자 책봉도 거친 적이 없이 당시에는 아예 승려로 출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상천황 존호를 받고 인세이를 행하는(고다카쿠라인) 해괴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조큐의 난 이후 인세이는 구게 정권의 중추로 그 역할을 다했다. 특히 조큐의 난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인세이를 행하게 된 고사가인(後嵯峨院) 때에 인세이의 여러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고사가인은 주사(奏事, 헨칸이나 쿠로우도에 의한 상주)를 전하는 직무인 전주(傳奏)를 제도화하고, 인이 가마쿠라 막부의 효죠슈(評定衆)와 같이 상론(소송)에 관여하는 인노효죠(院評定)를 확립하는 등 원정의 기능 강화에 애썼다.[19][20]
고사가인 이후 지묘인 왕통과 다이카쿠지 왕통이 서로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게 된 시대에는 실제 원정을 행하는 '치천의 군'이 천황의 아버지(혹은 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여야 할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다. 지묘인 왕통의 후시미 천황이 즉위했을 때 그의 친아버지 고후카쿠사인(後深草院)이 인세이를 실시하면서 후시미 천황의 전임 천황인 다이카쿠지 왕통의 고우다 상황(後宇多上皇)이 이를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고우다인의 아들인 고니조 천황이 즉위했을 때에는 후시미 상황이 아닌 고니조 천황의 아버지 고우다인이 인세이를 행했다. 덧붙여 이때 후시미 상황의 태자로서 고후시미인(後伏見院)의 동생인 후쿠히토 친왕(훗날의 하나조노 천황)이 태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고후시미인의 조카로 여겨졌다(《황년대략기》 · 《신황정통기》등). 하나조노 천황이 즉위한 뒤에는 후시미인이 원정을 행했다가 쇼와(正和) 2년(1313년) 10월 17일에 '치천의 군'의 지위가 고후시미인에 양보되어(《일대요기》), 4년 뒤에 후시미인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조노 천황은 친아버지의 장례를 할아버지의 예로 치렀다(《마스카가미》). 이는 본래는 하나조노 천황의 형인 고후시미인이 '치천의 군'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하나조노 천황과 조카 관계를 맺었으므로 본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후시미인과 하나조노 천황의 관계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로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묘인 왕통의 사례이고, 다이카쿠지 왕통의 사례는 확실하지 않다. 이후의 지묘인 왕통에서는 치천의 군으로 예정된 사람과 왕위 계승 예정자 사이에 '숙부-조카' 관계가 맺어져 '치천의 군'과 천황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의제되게 되었다(고코 천황과 고묘 천황 및 나오히토 친왕,[21] 고코마츠인과 고하나조노 천황).
6. 에도 시대와 인세이의 금지
에도 시대에는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竝公家諸法度)가 제정되어 에도 막부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간섭하면서, 왕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인세이는 계속되었다. 고미즈노 상황은 메이쇼 천황이 즉위한 뒤 인세이를 시작하여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레이겐 상황 때에는 조정과 막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25]
막부는 인세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는데, 이는 조정의 법령 체계를 벗어난 인세이의 특성 때문이었다. 고카쿠 천황이 아들 닌코 천황에게 양위하고 실시한 인세이가 일본 역사상 마지막 인세이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99년(메이지 22년)에 제정된 옛 황실전범은 천황의 생전 양위를 금지하고 사망에 의해서만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1947년에 제정된 현행 황실전범 또한 왕위 계승은 오직 천황의 사망으로만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라이 하쿠세키와 같은 에도 시대 유학자들은 인세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당시에는 왕가의 당주가 천황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조정을 주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에 황실전범이 제정되면서 왕위 계승은 법률에 따르게 되었고, '왕위에 있어야만 임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6. 1. 에도 시대의 인세이
에도 시대에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竝公家諸法度)를 제정한 에도 막부의 조정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왕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인세이는 유지되었다. 메이쇼 천황이 즉위한 뒤 고미즈노오 상황에 의한 인세이가 시작되었는데, 조정에서 실권을 갖지 못한 천황을 대신해 고미즈노오 상황에게 일본 조정의 실권이 집중되었다. 레이겐 상황이 인세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조정과 막부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25]막부는 인세이의 존재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 조정의 법령 체계가 정한 범위 바깥의 구조였던 인세이를 금중병공가제법도조차도 통제할 수가 없었고, 그것은 조정을 통제하려는 막부의 통치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꼴이었다.
에도 말기에 간인노미야(閑院宮) 출신의 고카쿠 천황이 아들 닌코 천황에게 양위하고 인세이를 행한 것이, 일본 역사에서의 마지막 인세이였다.
에도 시대의 인세이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상황 | 천황 |
|---|---|
| 고미즈노오 상황 | 메이쇼 천황, 고코묘 천황, 고사이 천황, 레이겐 천황 |
| 레이겐 상황 | 히가시야마 천황, 나카미카도 천황 |
| 히가시야마 상황 | 나카미카도 천황 |
| 사쿠라마치 상황 | 모모조노 천황 |
| 고카쿠 상황 | 닌코 천황 |
6. 2. 메이지 유신과 인세이의 금지
에도 시대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竝公家諸法度) 제정으로 에도 막부의 조정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왕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인세이는 유지되었다. 메이쇼 천황 즉위 후 고미즈노오 상황이 인세이를 시작했는데, 조정에서 실권을 갖지 못한 천황을 대신해 고미즈노오 상황에게 조정의 실권이 집중되었다. 레이겐 상황이 인세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조정과 막부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막부는 인세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조정 법령 체계 범위를 벗어난 인세이를 금중병공가제법도로 통제할 수 없었고, 조정 통제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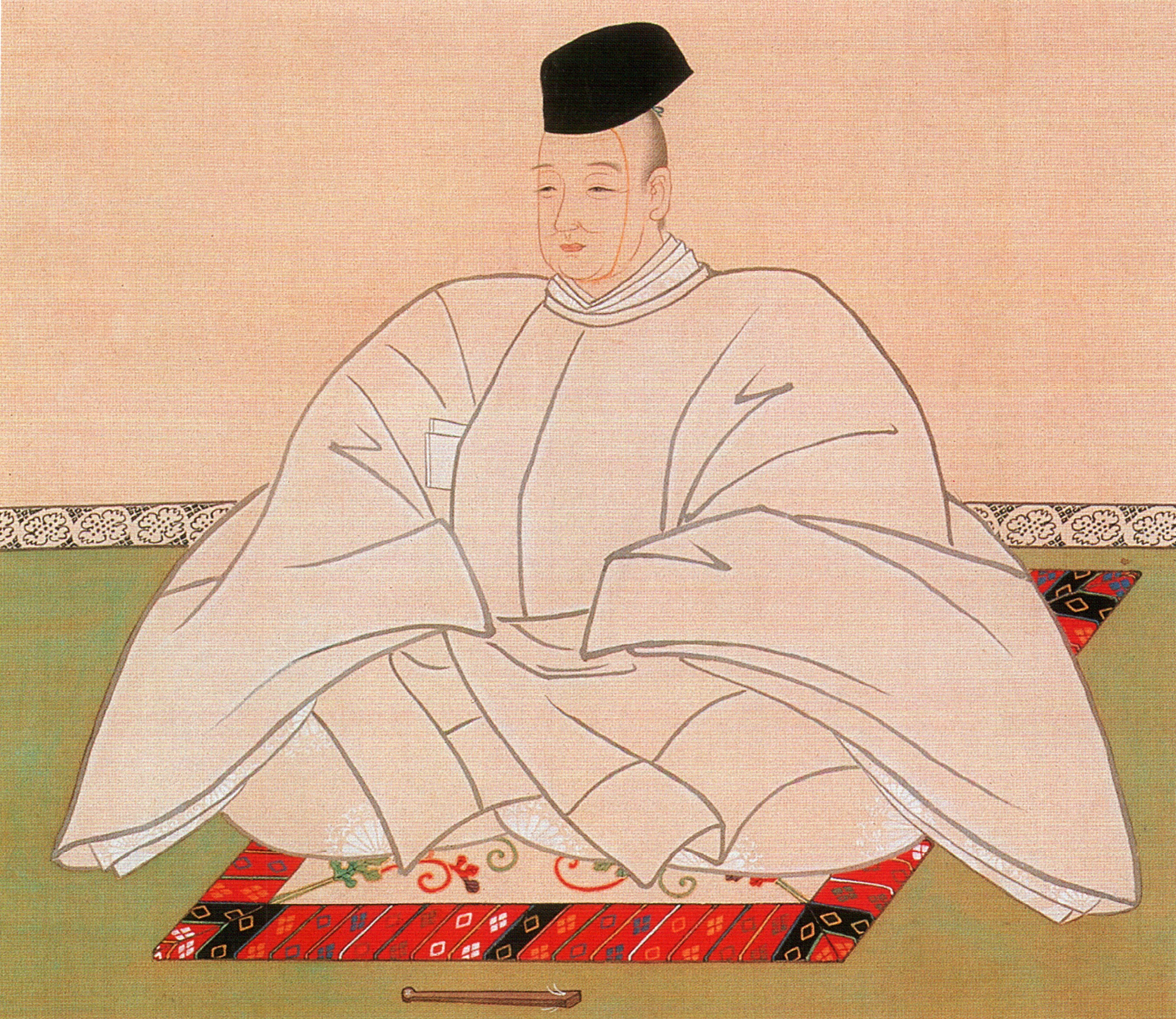
에도 말기 간인노미야 출신 고카쿠 천황이 아들 닌코 천황에게 양위하고 인세이를 행한 것이 일본 역사상 마지막 인세이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1899년(메이지 22년) 메이지 신정부가 제정한 옛 황실전범(皇室典範) 제10조는 "천황이 붕어할 시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하여 조종의 신기를 이어받는다"고 규정하여, '''천황의 생전 양위를 금지하고 천황의 승하(사망)에 의해서만 왕위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했다. 이로써 인세이의 전제가 될 ‘상황’의 존재는 부정되었다.
1947년 제정된 현행 황실전범 역시 제2조에서 황위 계승 순서, 제3조에서 순서 변경에 대한 규정을 통해 천황이 계승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고, 제4조에서 "천황이 붕어했을 때 황태자가 즉시 즉위한다"고 명시하여 왕위는 종신제이며 오직 사망에 의해서만 계승되도록 규정했다. 이는 2019년 아키히토가 생전 양위로 물러나 '상황'이 될 때까지 이어졌다.
아라이 하쿠세키 등 에도 시대 일본 유학자들은 인세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당시에는 왕가(천황 지위 세습 가계)의 '당주'를 둘러싼 '조정'에서 정무를 누가 맡든 '''왕가 당주가 현역 재위 중인지 여부'''의 차이로만 인식했던 것 같다. 왕가 당주라면 현역 천황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주재할 수 있었고, 은퇴해도 천황으로서 지위나 권한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이지 시대 황실전범 제정은 왕위 계승이 '관습'보다 '법률' 우선임을 의미했고, 기존의 '조정'의 본연의 자세를 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왕위에 있어야만 임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양위하고 은퇴한 임금은 지위도 권한도 사라진다'는 개념이 생겨났고, 이후 일본인의 일반적인 원정관이나 전문가의 인세이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7. 원정의 특수성과 세계사적 비교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왕정 국가는 왕위를 종신제로 하여, 국왕이 사망할 때까지 재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왕이 실권자에 의해 권력을 잃거나 건강 등의 문제로 정무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인물에게 실권을 양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본만큼 흔하지 않았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에스파냐 국왕을 겸했던 카를 5세는 정무에 대한 피로와 병으로 퇴위하여 수도원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처럼 양위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군주로서의 실권을 대폭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양위 후에도 실권을 유지했던 일본의 인세이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원정(院政)과 같이 명목상 최고 권력자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분리된 사례는 베트남의 쩐 왕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제도화된 경우는 드물다.
중국에서는 조의 무령왕, 남송의 효종, 청의 건륭제 등이 군주 자리를 후계자에게 양위한 후에도 권력을 유지했지만, 이는 항구적인 제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실권을 유지한 채 후계자를 군주로 즉위시키는 Coregency|공동 통치자영어 방식을 취했다. 이는 세습제가 아닌 로마 제국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선거 왕제 하에서 황제가 적자를 공동 로마 왕으로 선출하여 합스부르크 왕가의 사실상 세습을 가능하게 했다.
카스티야 여왕 베렌게라는 페르난도 3세를 왕위에 즉위시킨 후 후견인이 되었으나, 여성 군주의 즉위 자체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제도화되지는 않았다.[28]
일반적으로 군주가 양위하면 실권도 함께 내려놓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퇴위 후 완전히 은퇴했고, 아라곤 왕 라미로 2세와 카를 5세는 수도원에서 여생을 보냈다. 페트로닐라는 아들에게 양위했다. 근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도 군주는 양위와 함께 실권을 내려놓았다.
7. 1. 일본 고유의 가독(家督) 제도와 은거(隠居)
왕위를 양도한 자가 후계 군주의 후견으로서 실질적인 정무를 실시한다는 형태의 정치체제는 일본 고유의 가독(家督) 제도에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당주가 살아있는 동안 은거하며 가독을 다음 대에 넘겨주고 자신은 집안의 실권을 계속해서 장악한다는 '은거'의 개념은 꽤 오래전부터 일본 땅에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일본인의 사상에서 '국가' 및 '집안'의 개념이 정착해가던 야요이 시대에 확립되었다는 설도 존재한다.)막부의 경우에도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의 최고 수장인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자리를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물러나 오고쇼(大御所)가 되어 히데타다의 후견 역할을 맡은 일도 인세이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무가인 다이묘 집안뿐 아니라 공가나 신직, 일반 서민의 가정 등 사회 곳곳에 이러한 '은거' 제도는 침투하고 있어, '인세이'라는 정치 체제도 결국 '은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은거' 제도는 일본에서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꽤 오랜 시간을 항구적인 제도로서 존속한 것 역시 세계사적으로도 몹시 드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왕실을 제외하고는 조선의 태종이나 베트남의 쩐 왕조, 혹은 남송의 효종이나 청(淸)의 건륭제(乾隆帝) 등이 보위를 후사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여 상왕이 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황실전범의 시행에 따라 천황이 생전에 전위하여 상황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게 되었고, 또한 급속한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라 가독 제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은거 제도는 차츰 힘을 잃어 결국 일본국헌법에 따라 법적으로 가독 제도와 함께 폐지되었다.
7. 2. 세계사적 비교와 인세이의 특수성
왕위를 물려준 사람이 후계 군주의 후견인으로서 실질적인 정무를 담당하는 정치 체제는 일본 고유의 가독(家督) 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당주가 살아있는 동안 은거하며 가독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자신은 집안의 실권을 계속 장악하는 '은거' 개념은 일본에서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구체적인 시작 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인의 사상에서 '국가' 및 '집안' 개념이 정착해가던 야요이 시대에 확립되었다는 설도 있다.)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의 최고 수장인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자리를 도쿠가와 히데타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물러나 오고쇼(大御所)가 되어 히데타다의 후견 역할을 맡은 것도 인세이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무가인 다이묘 집안뿐 아니라 공가나 신직, 일반 서민의 가정 등 사회 곳곳에 이러한 '은거' 제도는 침투해 있었고, '인세이'라는 정치 체제도 결국 '은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은거' 제도는 일본에서만 존재하며, 꽤 오랜 시간을 항구적인 제도로서 존속한 것 역시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였다. 일본 왕실을 제외하고는 조선의 태종, 베트남의 쩐 왕조, 남송의 효종, 청(淸)의 건륭제(乾隆帝) 등이 왕위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여 상왕이 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군주들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재위하며 생존 중에 은퇴하지 않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왕정 국가가 왕위를 종신제로 하고 있어서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국왕이 당시의 실권자에 의해 권력을 잃거나, 건강 등 국왕 본인에게 다른 결함이 있어서 정무를 더는 맡지 못해 다른 인물에게 실권을 양보하는 등의 사례는 앞에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만큼 많지 않았다.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희소해지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에스파냐의 국왕을 겸했던 카를 5세는 정무에 대한 피로와 병이 겹쳐 퇴위하고 나머지 일생을 수도원에서 보냈다. 또한 이렇게 한 번 양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은 군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실권을 대폭 포기했고, 양위 뒤에도 실권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던 인세이와 같이 놓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의 원정(院政)처럼, 명목상의 최고 권력자와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의 분리가 상시화된 사례는 베트남의 쩐 왕조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원정에 유사한 정치 형태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제도화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조의 무령왕, 남송의 효종, 청의 건륭제 등은 군주의 자리를 후계자에게 양위한 후에도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항구화되는 일은 없었다.
유럽에서는 실권을 유지한 채 후계자를 군주로 즉위시키는 경우 Coregency|공동 통치자영어에 앉히는 방식을 취했다. 여러 군주가 나란히 서는 이 방법은 형식상 세습제가 아닌 로마 제국에서 특히 자주 사용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이 선거 왕제로 바뀌면서 재위 중인 "황제 겸 로마 왕"이 적자를 "공동 로마 왕"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통해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한 장기간의 사실상 세습이 이루어졌다.
카스티야 여왕 베렌게라는 페르난도 3세를 왕위에 즉위시킨 후 그의 "후견인"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 군주의 즉위 자체가 항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도화하지는 않았다.[28]
일반적으로 군주의 자리를 후계자에게 양위하면 실권도 놓게 된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퇴위로 완전 은퇴했고, 아라곤 왕 라미로 2세와 신성 로마 황제와 스페인 왕을 겸임한 카를 5세 (카를로스 1세)는 여생을 수도원에서 보냈다. 아라곤 여왕 페트로닐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양위했다. 근대의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도 군주는 양위하면 실권도 놓게 된다.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황실전범의 시행과 함께 천황이 생전에 전위하여 상황으로 물러나는 일은 없게 되었고, 또한 급속한 서구 문물의 유입에 따라 가독 제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은거 제도는 차츰 힘을 잃어 결국 일본국헌법에 따라 법적으로 가독 제도와 함께 폐지된다.
7. 3. 비유적 표현으로서의 원정
왕위를 양도한 사람이 후계 군주의 후견인으로서 실질적인 정무를 수행하는 정치 체제는 일본 고유의 가독 제도에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당주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은거하여 가독을 다음 세대에 양도하고, 가문의 실권을 계속 장악하는 '은거' 제도는 일본에서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의 정이대장군 직에서 물러나 오고쇼가 되는 것도 원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무가 사회뿐만 아니라 공가와 신관직,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도 은거 제도는 널리 퍼져 있었으며, 원정 자체가 은거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29]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황실전범의 시행으로 천황이 은퇴하여 상황이 되는 것은 없어졌다. 또한 서양 문화의 유입으로 가독 제도에 대한 일본인의 사고방식이 변화하면서 은거 제도는 쇠퇴했고, 일본국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가독 제도와 함께 폐지되었다.
하지만, 현대에도 기업 등에서 사장에서 물러난 회장, 명예 회장 등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은퇴한 사람이 은퇴 후에도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원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회장이 원정을 펼친다"와 같이 사용되며, 어떤 사람이 최고 직위에서 물러났는데도 실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운영이나 정치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29]
기업 운영대표이사사장에서 퇴임하고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시킨 후에도, "회장"이라는 존재가 되어 기업 운영의 실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을 "원정"이라고 한다.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후계자를 통해 실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30]
정치 권력국제 정치에서도 원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러시아 연방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탄뎀 체제는 당시 대통령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아니라, 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하여, "푸틴에 의한 원정"이라고 표현되었다. 또한, 장쩌민이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공산당 총서기·국가 주석 자리를 후진타오에게 넘겨주고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던 2년 동안은 "장쩌민의 원정"이라고 표현되었다.[31]
최근 일본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사람이 총리대신을 그만두어도 여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원정"이라고 비유된다. 예를 들어, 다케시타 노보루 정권 퇴진 후의 우노 소스케 정권·가이후 도시키 정권이 "다케시타 원정"[32][33], 아베 신조 정권 퇴진 후의 스가 요시히데 정권·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아베 원정" 또는 "아소 원정"이라고 불렸다.
참조
[1]
서적
"''Insei''"
https://books.google[...]
Google books
2005
[2]
서적
The Imperial House of Japan
1959
[3]
서적
"''In''"
https://books.google[...]
Google books
[4]
서적
History of Japan to 1334
https://books.google[...]
1958
[5]
서적
"''Hō-ō''"
https://books.google[...]
Google books
[6]
서적
日本大百科全書
[7]
서적
デジタル大辞泉
[8]
간행물
NHK高校講座 日本史
[9]
서적
日本外史
[10]
서적
日本外史
[11]
문서
2002
[12]
문서
2018
[13]
문서
[14]
문서
[15]
문서
2011
[16]
문서
2013
[17]
문서
2018
[18]
문서
2006
[19]
문서
2016
[20]
문서
2016
[21]
서적
光厳院御集全釈
風間書房
2000
[22]
문서
2013
[23]
서적
室町の覇者 足利義満―朝廷と幕府はいかに統一されたか
筑摩書房
2020
[24]
서적
室町期廷臣社会論
塙書房
2014
[25]
문서
2013
[26]
문서
1986
[27]
문서
2007
[28]
문서
[29]
문서
[30]
뉴스
“お家騒動の血”が騒ぐ! NEC矢野新会長院政のムリクリトップ人事(1)
http://wjn.jp/articl[...]
週刊実話
2010-03-11
[31]
뉴스
2年間は江沢民院政で合意 02年党大会で指導部
https://web.archive.[...]
共同通信
2005-02-07
[32]
뉴스
宇野首相、足元固めへ長老めぐり 「粉骨砕身」と協力要請 派閥解消へ声高く
読売新聞社
1989-06-15
[33]
뉴스
'[90総選挙 話題の人最前線] リクルート事件みそぎへ執念(連載)'
読売新聞社
1989-12-26
[34]
문서
[35]
문서
[36]
문서
도바 천황이 원래 후계로 지명한 것은 니조 천황 자신이었고, 니조 천황의 아버지인 마사히토 친왕 즉 고시라카와 천황을 굳이 태자 책봉도 없이 즉위하게 한 것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제치고 아들이 먼저 즉위할 수는 없다"는 유교적 명분론에 의해서였으며, 고시라카와 천황의 즉위는 당시 나이가 어렸던 니조 천황이 나이가 차서 친정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징검다리 계승'이라는 성격이 더 강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