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은 1866년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제국 간에 벌어진 전쟁으로, 독일 통일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문제로 촉발된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독일 연방을 해체했으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하노버, 헤센 등을 병합하여 북독일 연방을 결성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서 배제되었고,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이후 독일 제국 성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 프라하 평화 협정 (1866년)
프라하 평화 협정은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의 결과로 독일 연방 해체 및 프로이센 주도 북독일 연방 결성, 오스트리아의 독일 통일 불간섭 약속,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등 프로이센 합병, 베네치아의 이탈리아 왕국 귀속을 내용으로 한다. -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관계 - 올뮈츠 협약
올뮈츠 협약은 1850년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굴복하여 소독일주의에 입각한 독일 통일을 포기한 협정으로, 프로이센에게는 '올뮈츠의 굴욕'으로 여겨지며 군사적 수단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배경
19세기 중반, 독일은 여러 개의 독립된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통일된 독일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당시 독일에는 강력한 국가 의식이 없었고,[1] 종교적 분열도 심각했다.[3] 1848년 혁명의 실패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해산되면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운동은 큰 타격을 입었다.[5]
이러한 상황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통일은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닌 오직 '철혈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7]
2. 1. 독일 연방과 민족주의 대두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경쟁, 유럽 협조 체제수세기 동안 중앙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작고 독립적인 여러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18세기 말,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실레지아를 점령하는 등 점차 강력해져 유럽의 강대국 중 하나로 꼽혔다.[1] 프란츠 2세가 1806년에 신성 로마 황제의 지위를 폐지하면서 독일어 사용 유럽 대부분에 대한 제국의 권위는 사라졌지만, 오스트리아는 광대한 다민족 제국에 대한 확고한 통제력을 유지했다. 1815년 이후, 독일 국가는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는 독일 연방으로 재편되었다.[1] 프로이센은 1850년부터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의 우위에 도전했지만, 물러섰다.[1]
19세기 후반, 제2차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도 중공업 발전의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소국 분립 상태에서는 경제적 통합이 어려웠고, 이는 독일 민족의 통일을 요구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켰다.
하지만 통일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특히, 오스트리아 제국을 통일 독일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큰 문제였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인 지역 외에도 다수의 슬라브족, 마자르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입장이 나타났다.
과거 나폴레옹 전쟁 등에서 협력했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였지만,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 아래 프로이센이 군비 증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프로이센은 제2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쟁 (1864년)에서 오스트리아와 연합하여 덴마크 왕국을 격파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을 공동 관리했지만, 이는 비스마르크의 책략이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관리 지역에 개입하여 오스트리아를 격노하게 만들었고, 이는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으로 이어졌다.
2. 2.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갈등
오스트리아-프로이센 경쟁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중앙유럽의 주도권 다툼이었다.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통해 오스트리아로부터 실레지아를 빼앗으며 성장했다. 1815년 이후 독일 연방이 결성되었지만,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주도권에 지속적으로 도전했다.19세기 후반,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내에서는 통일 국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통일 방식을 두고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통일을 주장하는 대독일주의와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추구하는 소독일주의가 대립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 수상은 '철혈 정책'을 통해 군비를 증강하며 오스트리아와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그는 제2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와 협력하여 덴마크 왕국을 격파했지만, 이는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9]
당시 독일에는 강력한 국가 의식이 존재하지 않았고,[1] 종교적 분열도 심각했다.[3] 이러한 상황에서 비스마르크는 "피와 철"을 통해서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7] 그는 1866년 프로이센-이탈리아 동맹을 체결하여 오스트리아를 고립시키고, 다른 유럽 열강들의 중립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10]
2. 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문제
제2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쟁 이후, 프로이센 왕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은 덴마크 왕국으로부터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의 지배권을 획득하여 공동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지역의 처우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29]프로이센은 슐레스비히에, 오스트리아는 홀슈타인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1866년 6월 7일, 슐레스비히에 주둔하던 프로이센군이 홀슈타인을 침입하면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이 발발했다. 오스트리아는 홀슈타인 침공을 독일 연방 의회에 호소했고, 독일 연방은 프로이센을 토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프로이센은 독일 연방을 탈퇴했다.[29]
결국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프로이센의 지배지가 되었고, 폰 실브레센이 새로운 주 총독으로 임명되었다.[30]
3. 전쟁의 발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은 1864년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 종전 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덴마크로부터 정복하여 공동 점령하기로 합의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관리를 두고 벌어진 분쟁으로 인해 발발했다. 1866년 1월 26일, 프로이센은 홀슈타인의 오스트리아 총독이 공작령 의회가 연합 회의를 소집하도록 허용한 결정에 항의하며, 오스트리아의 결정이 공동 주권 원칙을 위반했다고 선언하면서 위기가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는 2월 7일에 답변하여, 자국의 결정이 공작령에서 프로이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866년 3월,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과의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했고, 프로이센은 5개 사단의 부분 동원으로 대응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오스트리아를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른 유럽 열강들이 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1866년 4월 8일 프로이센-이탈리아 동맹을 맺었다. 당시 다른 모든 유럽 열강들은 동맹에 묶여 있거나,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 열강들이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영국''': 영국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에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었다.
- '''러시아''': 러시아는 크림 전쟁 동안 오스트리아가 반러시아 동맹을 지지했던 것에 대한 악감정, 그리고 프로이센이 1월 봉기 동안 러시아를 지지하며 1863년 2월 러시아와 알벤슬레벤 협약을 체결한 반면 오스트리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편에 설 가능성이 낮았다.[10]
- '''프랑스''': 프랑스 역시 오스트리아 편에 설 가능성이 낮았는데, 비스마르크와 나폴레옹 3세가 비아리츠에서 만나 잠재적인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에 프랑스가 개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이다. 논의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비스마르크가 전쟁 발생 시 프랑스의 중립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한다. 비스마르크는 수적 우위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국제 정세에 대한 유리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권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11]
프로이센의 승리가 분명해지자 프랑스는 팔라티네이트, 라인헤센 및 룩셈부르크에서 영토 할양을 시도했다. 비스마르크는 1871년 5월 2일 국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 발발 직전, 프로이센 군은 여러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알브레히트 폰 룬은 1862년, 모든 프로이센 시민이 징병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군대 개혁을 시행했다. 3년간의 보편적 징병 제도를 도입하여 현역 군대의 규모를 늘렸고, 프로이센은 몰트케가 오스트리아에 대항하여 배치한 것과 같은 규모의 예비군을 확보했다.
프로이센의 징병 복무는 지속적인 훈련의 연속이었던 반면, 오스트리아 군대에서는 일부 지휘관들이 보병 징집병들을 군대에 입대시킨 직후 영구 휴가를 보내고, 공식적인 사열과 일상적인 임무를 위해 소수의 장기 복무 병사들만 남겨두는 경우가 있었다.[13] 따라서 프로이센 군대는 오스트리아 군대보다 더 잘 훈련되고 규율이 잡혀 있었다.

프로이센 보병은 오스트리아군의 전장식 로렌츠 소총보다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볼트 액션 소총인 드라이제 니들 건(Dreyse needle gun)을 장비했다.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의 전장식 평활포보다 우수한 후장식 강선포를 장비했다. 그러나 프로이센 고위 지휘부가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꺼리고 포병 부대의 교리적 침체로 인해, 최신 크루프 포는 예비 부대로 보내지거나 평활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전쟁에서 효과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실제 전투에 참여한 많은 포는 구식 평활포 전장식 포였다.
프로이센군 장군들은 오스트리아 적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 전술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장교들을 대서양을 건너 미국 남북 전쟁을 관찰하도록 보냈다. 이 장교들은 프로이센으로 돌아와 이러한 관찰 내용을 장군들에게 보고했다.
3. 1. 이탈리아와의 동맹
1866년 4월 8일, 프로이센은 이탈리아 왕국과 동맹을 맺었다.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롬바르디아-베네치아 왕국을 원했기 때문에 프로이센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 비스마르크는 이탈리아가 베네치아를 얻을 때까지 별도의 평화를 맺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 동맹으로 오스트리아는 독일 외 동맹국 없이 이탈리아와 프로이센 양쪽 모두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6월 20일에는 오스트리아의 베네토 영유에 불만을 품은 이탈리아 왕국도 프로이센과 동맹하여 선전 포고를 했고, 이 시작되었다.[29]
3. 2. 전쟁의 시작
1866년 6월, 프로이센 군은 오스트리아가 관리하던 홀슈타인을 점령했다.[29]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에 프로이센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고, 독일 연방은 이를 승인했다. 프로이센은 독일 연방 탈퇴를 선언하고,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했다.[29] 하노버 왕국, 작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 등 대부분의 독일 국가들은 오스트리아를 지지했다.[15]6월 15일, 프로이센은 홀슈타인의 오스트리아 관리 지역을 점령하고, 독일 연방에서 반 프로이센 표를 던진 작센 왕국, 하노버 왕국, 헤센 선제후국 3개국에 대해 중립과 군비 해제를 요구했다. 답변이 없자, 프로이센은 이들 국가에 선전포고를 하고 16일부터 침공을 시작했다.[31]
6월 20일에는 이탈리아 왕국도 프로이센과 동맹하여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4. 주요 군사 작전
1862년, 폰 룬은 모든 프로이센 시민이 징병될 수 있도록 하는 군대 개혁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군대 규모가 법률로 고정되어 징병이 불공정하고 인기가 없었다. 3년간의 보편적 징병 제도를 도입하여 현역 군대 규모를 늘렸고, 프로이센은 몰트케가 오스트리아에 대항하여 배치한 것과 같은 규모의 예비군을 확보했다.[13]
프로이센의 징병 복무는 지속적인 훈련의 연속이었던 반면, 오스트리아 군대는 징집병들을 입대시킨 직후 영구 휴가를 보내고, 소수의 장기 복무 병사들만 남겨두는 경우가 있었다.[13] 따라서 프로이센 군대는 오스트리아 군대보다 더 잘 훈련되고 규율이 잡혀 있었다.
프로이센 보병은 드라이제 니들 건(Dreyse needle gun)을 장비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군의 전장식 로렌츠 소총보다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볼트 액션 소총이었다. 오스트리아군은 제2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 이후 Stoßtaktikde ("충격 전술")를 채택했지만, 프로이센 무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를 유지했다.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의 전장식 평활포보다 우수한 후장식 강선포를 장비했다. 오스트리아 포병은 빌헬름 렌크 폰 볼프스베르크(Wilhelm Lenk von Wolfsberg)가 발명한 고유한 강선 시스템인 렌크 시스템을 사용했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이 시점에서 1859년부터 생산된 기술적으로 우수한 C64 (야포)로 평활포 포병의 최대 60%를 교체했다. 그럼에도 프로이센 고위 지휘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교리적 침체로 인해, 최신 크루프 포는 전쟁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13]
7년 만에 일어난 두 주요 유럽 열강 간의 첫 전쟁으로, 징집 기간 동안 병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철도와 장거리 통신을 강화하기 위한 전신을 포함하여 제2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과 동일한 기술을 많이 사용했다. 프로이센군은 폰 드라이제의 후장식 바늘총을 사용했는데, 이는 병사가 엄폐물을 찾는 동안 신속하게 장전할 수 있었던 반면, 오스트리아의 전장식 소총은 느리게, 일반적으로 서 있는 자세에서만 장전할 수 있었다.
전쟁의 주요 작전은 보헤미아에서 벌어졌다. 프로이센 참모총장 헬무트 폰 몰트케는 전쟁을 세심하게 계획하여, 프로이센군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국경을 넘어 작센과 보헤미아로 진격했다.
작센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은 다른 독일 국가들은 주요 작전에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노버군은 제2차 랑겐살차 전투에서 프로이센을 격파했지만, 며칠 안에 항복했다. 프로이센군은 마인 강에서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헤센 국가들과 싸웠고, 뉘른베르크와 프랑크푸르트에 도달했다.
오스트리아군은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더 성공을 거두어, 육상에서는 쿠스토차 전투 (6월 24일)에서, 해상에서는 리사 해전 (7월 20일)에서 이탈리아군을 격파했다. 그러나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알프스 사냥꾼"은 베체카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트렌토로 진격했다.
4. 1. 보헤미아 전역
프로이센군은 세 방향으로 나뉘어 보헤미아로 진격했다.[43]
1866년 6월 15일, 프로이센은 작센 왕국에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거절당했다. 다음 날인 6월 16일, 엘베군이 작센을 침공하여 6월 18일 수도 드레스덴을 점령했다. 작센군은 알베르트 왕자의 지휘 아래 보헤미아로 이동하여 오스트리아 제1군단과 합류했다.[43]
프로이센군은 분진합격을 계획하며 보헤미아로 진격했다. 오스트리아군의 베네데크 원수는 프로이센군의 주력이 이 방면에 있다고 판단하여 올로모우츠를 떠나 엘베강 상류의 요새까지 전진했다. 6월 19일, 프로이센 엘베군은 제1군과 합류하기 위해 동진하여 6월 25일경 보헤미아 평야 북단 가벨시에 도착했다. 프로이센 제1군은 괴를리츠를 출발하여 프리트란트, 치타우 산지를 넘어 오스트리아군에 의해 파괴된 철도를 수리하며 6월 25일 보헤미아 분지의 라이헤르부르크에 도착, 엘베군과 함께 진격 태세를 갖추었다.[43]
분산 진격해 오는 프로이센군 앞에서 오스트리아군은 7월 3일 쾨니히그레츠 전투에서 포위되어 대패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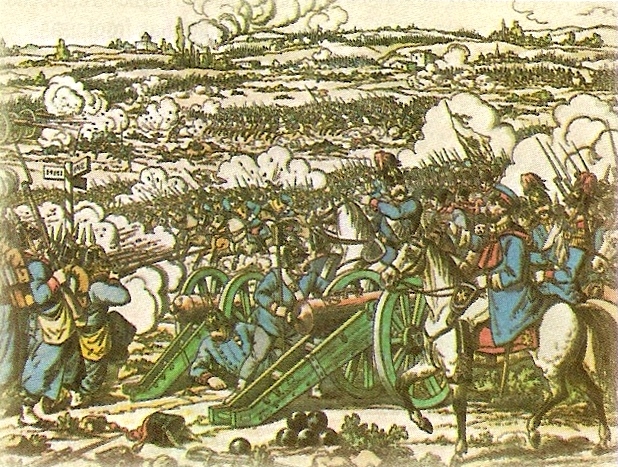
프로이센군은 튼튼하고 장전 시간이 짧은 강철제 후장식 대포와 세계 최초의 후장식 군용 소총을 장비하여 장비 면에서도 오스트리아군을 크게 앞섰다. 프로이센군의 신무기가 가진 압도적인 화력과 빠른 사격 속도 앞에서, 이전 방식대로 총검 돌격을 반복하는 오스트리아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다.
4. 2. 독일 서부 전역
프로이센군은 하노버 왕국, 헤센 선제후국 등 오스트리아 동맹국들을 빠르게 제압했다. 6월 15일, 프로이센은 이들 국가에 중립과 군비 해제를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16일부터 침공을 시작했다.[31]프로이센군은 세 방향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북쪽에서는 만토이펠 군이 함부르크에서 남진, 서쪽에서는 겝펜 군이 민덴에서 동진하여 하노버를 목표로 했고, 남쪽에서는 베엘 군이 베츨러에서 카셀로 북진하여 포위망을 좁혔다. 하노버군은 제대로 싸울 준비가 부족했고, 오스트리아 제국 측 다른 군대도 흩어져 있어 제대로 돕지 못했다. 결국 하노버 왕은 6월 29일 항복했고, 하노버 왕국은 멸망했다.[38]
랑겐잘차 전투에서 하노버군은 프로이센군에게 승리했지만, 결국 프로이센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다. 6월 27일, 하노버군은 랑겐잘차에서 프로이센군 프리제 여단을 상대로 승리했다. 하노버군은 전사자 약 360명, 부상자 1,050명으로 총 1,400명의 손실을 보았지만, 프로이센군은 사상자 약 900명, 포로 약 1,000명, 소총 약 2,000정을 잃었다.[37] 그러나,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노버군은 결국 프로이센군에 항복해야 했다.
4. 3. 이탈리아 전선
1866년, 이탈리아 왕국은 프로이센 왕국과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탈리아군은 쿠스토차 전투와 리사 해전에서 오스트리아군에게 패배했다.[13] 그러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를 이탈리아에 넘겨주어야 했다.
5. 전쟁의 결과
1866년 8월 23일, 프라하 조약이 체결되면서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이 종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 영토를 요구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만 요구했다. 그러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 전역과 하노버 왕국, 헤센 선제후국, 나사우 공국, 프랑크푸르트 자유시를 병합하여 독일 내 프로이센 영토를 통합하고, 오스트리아를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제외했다.
이 전쟁은 징병 기간 동안 병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철도와 장거리 통신을 위한 전신 등 제2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과 동일한 기술을 많이 사용했다. 프로이센군은 폰 드라이제의 후장식 바늘총을 사용해 신속한 장전이 가능했던 반면, 오스트리아의 전장식 소총은 장전 속도가 느렸다.
주요 전투는 보헤미아에서 벌어졌으며, 헬무트 폰 몰트케는 프로이센군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오스트리아군을 쾨니히그레츠 전투에서 격파했다. 오스트리아의 전사자는 프로이센의 7배에 달했다. 7월 22일, 양국 간 휴전이 발효되었고,[5] 7월 26일 니콜스부르크에서 예비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6]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은 다른 독일 국가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노버군은 제2차 랑겐살차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파했지만, 곧 항복해야 했다.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쿠스토차 전투와 리사 해전에서 승리했지만, 주세페 가리발디가 이끄는 이탈리아군은 베체카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트렌티노로 진격했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10월 12일 빈 조약을 통해 베네토를 프랑스에 양도했고, 프랑스는 이를 다시 이탈리아에 넘겼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전쟁 개입을 시도했지만, 비스마르크는 더 이상 관여할 의사가 없어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후 프로이센은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여 독일 제후들의 맹주가 되었고, 보불 전쟁 (1870-1871)에서 프랑스를 격파하여 독일 통일을 이룩했다. 오스트리아는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성립시키고, 도나우 강 유역 통치에 집중하게 되었다.
5. 1. 독일 연방 해체와 북독일 연방 수립
1866년 8월 23일 프라하 조약으로 독일 연방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서 영구히 배제되었다.[15] 프로이센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 하노버 왕국, 헤센 선제후국, 나사우 공국, 프랑크푸르트 자유시를 합병했다.[15] 이로써 프로이센은 독일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는 여러 독일 국가 병합에 반대했지만, 비스마르크의 압박으로 결국 병합을 추진하게 되었다.[15]
1867년, 프로이센은 마인강 이북의 독일 국가들을 모아 북독일 연방을 수립했다. 이로써 독일 통일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프로이센에 합병된 지역에서는 저항과 분리주의 정서가 강하게 나타났다. 하노버에서는 독일-하노버당이 창당되어 분리주의 운동을 주도했고,[17] 헤센과 나사우 등지에서도 반(反)프로이센 정서가 만연했다.[18][19][20] 이러한 저항은 1871년까지 계속되었지만, 결국 북독일 연방은 보불전쟁의 승리를 통해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를 포함한 남부 독일 국가들까지 통합하여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된다.[22]
다음은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의 주요 영토 변화이다.
전쟁 중 중립을 지켰던 리히텐슈타인은 독립 국가가 되었고,[23][24] 룩셈부르크와 림부르크는 런던 조약 (1867년)에 따라 네덜란드 왕국의 일부로 남았다.
5. 2.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성립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제국은 이듬해인 1867년 오스트리아-헝가리 타협을 통해 오스트리아-헝가리라는 이중 군주국으로 변모했다.[25] 헝가리 총리 줄러 앤드라시는 프로이센에 대한 복수전에 강력히 반대했다.[27]1866년 8월 23일 프라하 조약이 체결되면서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에서 제외되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 대해 영토를 요구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만 요구했다. 그러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 전역과 하노버 왕국, 헤센 선제후국, 나사우 공국, 프랑크푸르트 자유시를 영유하여 독일 동서의 프로이센 영토 통합을 달성했다. 오스트리아는 같은 해 10월 12일, 이탈리아 왕국과 개별 강화 조약(빈 조약)을 맺고 베네토 지방을 이탈리아에 할양했다.
5. 3. 독일 통일의 가속화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북독일 연방, 그리고 독일 통일까지 이끄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해석이 있다. 그는 북독일 연방과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을 통해 독일 통일을 이루고자 이 분쟁을 조율했다고 주장했다.[8]1866년 프로이센-이탈리아 동맹은 다른 유럽 열강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벽한 시기에 체결되었다. 영국은 이 전쟁에 관심이 없었고,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오스트리아가 반러시아 동맹을 지지했던 것과 프로이센이 1월 봉기 때 러시아를 지원한 것에 대한 악감정으로 오스트리아 편을 들지 않았다.[10] 프랑스는 비스마르크와 나폴레옹 3세의 비밀 회담을 통해 중립을 보장받았다고 여겨진다.[11]
프로이센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프랑스는 팔라티네이트, 라인헤센, 룩셈부르크 등 영토 할양을 시도했지만, 비스마르크는 이를 거부했다.[11]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나 러시아의 개입을 막고 "불필요한 반감이나 복수심"을 피하고자 빌헬름 1세에게 오스트리아와 빠르게 평화 협정을 맺도록 압박했다.[15] 1866년 8월 23일 프라하 조약으로 독일 연방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서 영구히 배제되었다. 프로이센은 마인강 이북의 모든 독일 국가를 포함하는 북독일 연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영토를 요구하지 않아 미래에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16]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은 독일 정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병합된 지역에서는 저항과 분리주의 정서가 나타났다. 하노버의 게오르크 5세와 지역 주민들은 프로이센으로의 통합에 반대했고, 독일-하노버당을 창당하여 1871년 선거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17] 헤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병합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반병합 청원에는 많은 서명이 모였다.[19]
북독일 연방은 1871년에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를 병합하게 된다. 제프리 와우로에 따르면, 프로이센은 1866년에 북부 독일 국가를 병합하고, 1871년에는 "가톨릭 국가를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연방으로 강요"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22]
이 전쟁으로 독일 연방은 해체되었고, 중립을 지켰던 국가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리히텐슈타인은 독립 국가가 되어 영구 중립을 선언했고,[23] 림부르크와 룩셈부르크는 런던 조약 (1867년)에 따라 네덜란드 왕국의 일부가 되었다. 룩셈부르크는 독립과 중립을 보장받았지만, 관세 동맹에는 계속 남아있었다. 로이스-슐라이츠, 작센-바이마르-아이제나흐, 슈바르츠부르크-루돌슈타트는 북독일 연방에 가입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전쟁에 개입하려 했으나, 비스마르크는 더 이상 관여할 의사가 없어 휴전이 성립되었다. 1866년 프라하 조약에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에 영토를 요구하지 않았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국 전역과 하노버 왕국, 헤센 선제후국, 나사우 공국, 프랑크푸르트 자유시를 영유하여 독일 동서의 프로이센 영토 통합을 달성하고 오스트리아를 통일 독일에서 제외했다.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와 별도 강화 조약을 맺고 베네토 지방을 할양했다.
프로이센은 이후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여 독일 제후들의 맹주가 되었고, 보불 전쟁 (1870년 - 1871년)에서 프랑스를 격파하여 독일 통일을 실현하게 된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1867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성립시키고, 도나우 강 유역 통치에 전념하게 된다.
6. 전쟁의 영향과 역사적 의의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은 유럽의 세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의 빠른 평화 협정을 추진하여 프랑스나 러시아의 개입을 막고,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를 설득했다.[15] 1866년 8월 23일 프라하 조약을 통해 독일 연방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는 독일 문제에서 영구히 배제되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의 이전 동맹국 4개국을 병합하고, 다음 해 마인강 이북의 모든 독일 국가를 포함하는 북독일 연방을 결성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영토를 요구하지 않아 미래의 동맹 가능성을 열어두었다.[15]
이 전쟁으로 프로이센은 독일 정치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북부 국가들은 프로이센에 병합되는 것에 반대했다. 하노버에서는 하노버의 게오르크 5세와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고, 1871년 독일 연방 선거에서 독일-하노버당이 46.6%의 표를 얻었다.[17] 헤세와 같은 다른 병합된 지역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반병합 청원과 분리주의 청원이 조직되었다.[18][19] 나사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프로이센 군인들을 공격했다는 보고도 있었다.[20]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871년 북독일 연방은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를 병합하여 독일 제국을 수립했다. 프로이센의 군사적, 정치적 힘은 1866년 북부 독일 국가들을 병합하고, 1871년 남부 가톨릭 국가들을 강제로 연방에 편입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22]
7. 한국의 관점에서의 분석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은 19세기 유럽에서 벌어진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한국의 역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나 대중의 관심사는 주로 이 전쟁이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유럽의 세력 균형 변화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7. 1. 더불어민주당의 시각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현재 원본 소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7. 2. 진보 진영의 시각
진보 진영에서는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전쟁은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이루려는 비스마르크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참조
[1]
논문
Liberalism, nationalism and anti-semitism in the 'Berlin anti-semitism dispute' of 1879/1880
Middlesex University
2003
[2]
서적
Nationalism and society, Germany 1800–1945
Hodder Arnold
1988
[3]
서적
The Formation of the First German Nation-State, 1800–1871
Red Globe Press
1996
[4]
서적
The Formation of the First German Nation-State, 1800–1871
Red Globe Press
1996
[5]
서적
The Kingdom of Württemberg and the Making of Germany, 1815–1871
Bloomsbury 3PL
2017
[6]
서적
The Formation of the First German Nation-State, 1800–1871
Red Globe Press
1996
[7]
서적
Blood and Iron: The Rise and Fall of the German Empire 1871–1918
The History Press
2021
[8]
서적
Nineteenth Century Europe
Macmillan Press
1992
[9]
서적
Bismarck and the Development of Germany: The Period of Unification, 1815–1871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10]
웹사이트
A History of Modern Germany 1800–2000
https://ens9004-mza.[...]
Blackwell Publishing
2019-04-24
[11]
서적
Bismarck: A Political History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4
[12]
서적
Blood, Iron and Gold: How the Railways Transformed the World
2010
[13]
학술지
Through Artillery from Thrust to Fire: How Prussian Military Thinking Anticipated Emergent Warfare in 1870
2023-08-31
[14]
서적
Iron Kingdom: The Rise and Downfall of Prussi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15]
학술지
Prussia's Last Fling: The Annexation of Hanover, Hesse, Frankfurt, and Nassau, June 15 – October 8, 1866
1975
[16]
학술지
Prussia's Last Fling: The Annexation of Hanover, Hesse, Frankfurt, and Nassau, June 15 – October 8, 1866
https://www.jstor.or[...]
1975
[17]
서적
A Study in Particularist Opposition to National Unity
Springer Dordrecht
2011
[18]
학술지
From Sovereign States to Prussian Provinces: Hanover and Hesse-Nassau, 1866–1871
https://www.jstor.o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19]
서적
Making Prussians, Raising Germans: A Cultural History of Prussian State-Building after Civil War, 1866–19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0]
서적
Making Prussians, Raising Germans: A Cultural History of Prussian State-Building after Civil War, 1866–19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1]
서적
Making Prussians, Raising Germans: A Cultural History of Prussian State-Building after Civil War, 1866–193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2]
서적
The Franco-Prussian War: The German Conquest of France in 1870–18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23]
웹사이트
Sonderausstellung: '1866: Liechtenstein im Krieg – Vor 150 Jahren'
http://www.lie-zeit.[...]
2020-12-08
[24]
웹사이트
In 1866, 80 men went to war — this is why 81 came home
https://www.wearethe[...]
2023-11-21
[25]
서적
The Origins of the War of 1914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26]
서적
The Fall of the Third Napoleon
Cassell & Company Ltds
1970
[27]
서적
The Last Days of Papal Rome
https://archive.org/[...]
Archibald Constable & Co.
1909
[28]
서적
詳説世界史
山川出版社
2002-04-04
[29]
서적
伊藤1940
[30]
서적
伊藤1940
[31]
서적
伊藤1940
[32]
서적
伊藤1940
[33]
서적
伊藤1940
[34]
서적
伊藤1940
[35]
서적
伊藤1940
[36]
서적
伊藤1940
[37]
서적
伊藤1940
[38]
서적
伊藤1940
[39]
서적
伊藤1940
[40]
서적
伊藤1940
[41]
서적
伊藤1940
[42]
서적
伊藤1940
[43]
서적
伊藤1940
[44]
간행물
1867년의 오스트리아 군사 백서
http://archiv.ucl.ca[...]
Světozor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