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발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창발은 개별 요소에는 없는 성질이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일시적인 과정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이나 진화를 특징으로 하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철학 및 과학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창발은 단순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약한 창발과 강한 창발로 분류된다. 또한, 복잡계 과학, 생명, 사회, 정보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며,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인공 시스템에서도 나타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혼돈 이론 - 난류 (역학)
난류는 유체의 불규칙하고 무작위적인 운동 상태로, 일상생활과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되며 여러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혼돈 이론 - 나비 효과
나비 효과는 초기 조건의 작은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기상 모의 실험을 통해 발견되었고,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 토네이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유로 설명된다. - 복잡계 이론 - 사회 연결망
사회 연결망 분석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회적 구조와 행동을 이해하는 학제 간 연구 방법론으로, 다양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내 위치와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 복잡계 이론 - 동등 계층 생산방식
정보 부족으로 동등 계층 생산방식에 대한 정의, 특징, 사례 등을 설명하는 위키백과 개요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창발 - 연결주의
연결주의는 정신 현상을 단순한 단위들의 네트워크로 설명하는 인공지능 및 인지과학의 접근 방식이며, 뇌의 뉴런을 모방한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 창발 - 마음
마음은 의식, 사고, 지각, 감정, 동기, 행동, 기억, 학습 등을 포괄하는 심리적 현상과 능력의 총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인간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 정의
창발은 구성 부분에는 없는 성질이 전체로서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철학에서는 주로 체계의 속성에 대한 원인론적 주장으로 이해되며,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없지만 전체 체계의 특징으로 존재하는 속성을 의미한다.[1]
창발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존재했으며,[2] 존 스튜어트 밀(원인의 구성, 1843)[4], 줄리안 헉슬리[5] 등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이 개념에 대해 논했다.
G. H. 루이스는 1875년 "창발"이라는 용어를 "결과"와 구별하여 사용했다. 그는 창발이 구성 요소와는 가측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며, 구성 요소의 합이나 차이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다.[6]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화학 철학과 고전 역학의 발달 속에서 생명 현상의 정의를 둘러싼 생명론자와 기계론자 간의 논쟁을 기원으로 창발론이 철학적 논쟁으로 발전했다. 창발주의자는 초자연적인 물질이나 베르그송의 "엘랑 비탈" 같은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생명론과, 생명체의 특성을 단순 화학적·기계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기계론 양쪽 모두에 반대하며,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다"라고 주장한다.
2. 1. 창발의 정의
창발은 일시적인 과정이 아닌, 성장이나 진화와 같이 지속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냄새는 수소나 질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성 요소의 특성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42]"역학적 반응과 화학적 반응만을 알고 있는 자는 생명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 (S. Alexander, 공간, 시간 그리고 신, 1920)
"개개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들이 상호 작용했을 때에 나타날 것으로 결코 예상하지도 못한 동작이 그야말로 창조적으로 발현되는 것" (John. L. Casti, 1997)
창발성은 정의에 따라 단순한 물리법칙으로 나타낼 수 없다.[43] 철학자들은 종종 창발을 체계의 속성에 대한 원인론적 주장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의 창발적 속성이란 체계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의 속성도 아니지만, 전체 체계의 특징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발에 관해 글을 쓴 최초의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인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이를 "범주적 노붐"(새로운 범주)이라고 칭했다.[1]
창발의 개념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2] 존 스튜어트 밀(원인의 구성, 1843)[4] 과 줄리안 헉슬리[5] 등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이 개념에 대해 글을 썼다.
G. H. 루이스는 1875년 "창발"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를 단순히 "결과"와 구별했다. 그는 창발은 구성 요소가 가측 불가능한 만큼 구성 요소와 다르며, 그 합이나 차이로 환원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6]
"창발"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약한 창발"과 "강한 창발"의 두 가지 관점으로 세분될 수 있다. 철학자 마크 베도는 약한 창발을 물리 시스템에서 창발적 속성이 사후 분석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유사한 형태(예: 교통 체증 형성, 비행 중인 찌르레기 무리의 구조 또는 물고기 떼, 은하 형성)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정의했다.
데이비드 찰머스는 강한 창발과 약한 창발을 구분하지 못하여 철학과 과학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7]
두 개념의 공통점은 창발이 시스템이 성장하면서 생성되는 새로운 속성, 즉 구성 요소 또는 이전 상태와 공유되지 않는 속성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속성은 형이상학적으로 원시적인 속성이 아닌 슈퍼비니언스라고 가정한다.
약한 창발은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속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베도는 속성이 시스템을 관찰하거나 시뮬레이션함으로써만 결정될 수 있으며, 환원주의적 분석으로는 결정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창발적 속성은 '''규모 의존적'''이다. 혼돈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창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미시적 규모에서는 구성 요소의 행동이 완전히 결정론적 시스템일 수 있다.
베도는 의식이 약하게 창발적이라는 가설이 의식의 물리성에 대한 전통적인 마음의 철학적 질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약한 창발이 보편적인 형이상학적 용매가 아니라고 언급한다.
강한 창발은 고수준 시스템이 구성 요소에 직접적인 인과 작용을 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 방식으로 생성된 속성은 시스템의 구성 부분으로 환원 불가능하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강한 창발에서는 시스템을 구성 부분으로 축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리학은 강한 창발의 잘 확립된 예가 부족하다. 실제적 불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보다 더 유용한 구별일 수 있다.[8]
일부 사상가들은 강한 창발이 우리의 일반적인 물리학적 이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크 A. 베두는 강한 창발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환원 불가능한 하향적 인과적 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강한 창발은 인과적 과잉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재권 김은 M이 P∗을 야기함으로써 M∗을 야기한다고 할 때, 창발적인 M이 기본 조건 P에서 발생한다면, M의 어떤 추정된 효과의 원인으로서 P가 M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다. 만약 M이 원인으로 유지된다면, 하향적 인과 관계의 모든 경우가 과잉 결정을 포함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창발주의의 정신에 반한다.[9]
만약 M이 M∗의 원인이라면, M∗은 P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과잉 결정된다. 강한 창발주의자가 택할 수 있는 한 가지 탈출 경로는 하향적 인과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창발적 정신 상태가 물리적 상태에 상위해야 하는 이유를 제거하고, 유물론에 의문을 제기하여 일부 철학자와 물리학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 입장에서의 창발론에는 무수한 역사적 선례가 있지만, 창발의 개념이 명확하게 발전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있었다. 이 논의의 기원은 화학 철학과 고전 역학의 발달이라는 문맥 속에서, 생명 현상의 정의와 특징화를 둘러싼 생명론자와 기계론자의 논쟁에 있다. 창발주의자는 생명론자와 기계론자 양쪽에 반대한다. 생명론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물질이나 힘, 베르그송이 제창한 "엘랑 비탈"(생명의 약동)과 같은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계론에 대해서는 생명체의 특성을 단순한 화학적·기계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다"라고 주장한다.
2. 2. 창발 현상
창발 현상은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중앙 권력이나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 간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45] 예를 들어, 붉은악마 신드롬은 정부나 월드컵조직위원회의 계획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다.[45]"창발" 개념은 "약한 창발"과 "강한 창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철학자 마크 베도는 약한 창발을 물리 시스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 나타나는 창발 유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구성원들은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창발적 속성을 가진 새로운 개체가 형성되는데, 이를 강한 창발이라 하며 시뮬레이션, 분석,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데이비드 찰머스는 창발이 강한 창발과 약한 창발을 구분하지 못해 철학과 과학에서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7]
두 개념의 공통점은 시스템이 성장하면서 구성 요소나 이전 상태와 공유되지 않는 새로운 속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속성은 형이상학적으로 원시적인 속성이 아닌 슈퍼비니언스라고 가정한다.
약한 창발은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상호 작용으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속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속성은 시스템을 관찰하거나 시뮬레이션해야만 결정될 수 있으며, 환원주의적 분석으로는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창발적 속성은 규모 의존적이다. 혼돈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창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미시적 규모에서 구성 요소의 행동은 완전히 결정론적 시스템일 수 있다.
베도는 의식이 약하게 창발적이라는 가설이 의식의 물리성에 대한 전통적인 마음의 철학적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강한 창발은 고수준 시스템이 구성 요소에 직접적인 인과 작용을 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 속성은 시스템의 구성 부분으로 환원 불가능하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시스템을 구성 부분으로 축소하므로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리학은 강한 창발의 잘 확립된 예가 부족하다.
일부 사상가들은 강한 창발이 물리학적 이해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A. 베두는 강한 창발이 마법과 같이 불편하며, 환원 불가능하지만 상위에 있는 하향적 인과적 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강한 창발은 인과적 과잉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재권 김은 M이 M∗을 야기할 때, M∗은 P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과잉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철학적 입장에서 창발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발전했으며, 화학 철학과 고전 역학의 발달 속에서 생명 현상의 정의를 둘러싼 생명론자와 기계론자의 논쟁에서 기원한다. 창발주의자는 생명론자와 기계론자 양쪽에 반대하며,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다"라고 주장한다.
생명은 창발 현상의 덩어리이다. 동물의 줄무늬, 식물의 타이거 부시, 페어리 서클, 앨런 튜링의 튜링 패턴, 뇌의 신경 세포와 지능, 진화론에서의 돌연변이, 교차, 환경과의 상호 작용 등이 그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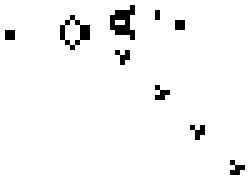
- '''유지''': 검은색 셀 주위에 2개 또는 3개의 검은색 셀이 있으면 다음 순간에도 그 셀은 검은색으로 남는다.
- '''사망''': 위의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다음 순간에 그 셀은 흰색 셀이 된다.
요소(여기서는 검은 점)가 불과 수십 개 존재하더라도 창발이 일어난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발 현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군집 지능, 웹 등이 그 예시이다.
2. 3. 창발성과 규칙
창발성은 규칙만 알아서는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다. 계를 작동시켜야만 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창발성을 가진 계는 단순한 논리 규칙을 따르지만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다는 이원론적인 특성을 지닌다.[46] 창발적 시스템은 학습과 성장, 그리고 실험의 가능성을 가지는데, 이는 저차원의 규칙을 엄격히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미들은 다른 개미들과 마주치는 패턴에 기초해 먹이를 조달할 것인지 다른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알렉사 소프트웨어는 클릭 패턴에 기초하여 연결을 만들어낸다.[46]위의 동영상은 격자 무늬로 되어 있으며, 각 격자(세포 자동자)는 모두 동일하며, 다음 3가지 단순한 규칙만으로 작동한다.
- '''탄생''': 흰색 셀 주위에 3개의 검은색 셀이 있으면 다음 순간에 그 셀은 검은색이 된다.
- '''유지''': 검은색 셀 주위에 2개 또는 3개의 검은색 셀이 있으면 다음 순간에도 그 셀은 검은색으로 남는다.
- '''사망''': 위의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다음 순간에 그 셀은 흰색 셀이 된다.
요소(여기서는 검은 점)가 불과 수십 개 존재하더라도 창발이 일어난다는 점이 중요하다.
2. 4. 창발적 지능
수많은 미시적 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거시적 행동을 창발적 지능이라고 한다. 떼 지능(swarm intelligence)은 개미, 흰개미, 꿀벌, 장수말벌 따위의 사회성 곤충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시이다.[47] 예를 들어, 개개의 개미는 집을 지을 능력이 없지만, 개미 집합체는 역할이 다른 개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처럼 하위 수준(낱낱의 개미)에는 없지만 상위 수준(개미의 집합체)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떼 지능이다.[47] 떼 지능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응용되고 있으며, 개미떼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응용한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다.[47]3. 창발성과 자기조직화
창발성은 모든 복잡계가 보여주는 특성이다. 하위 수준(구성 요소)에는 없는 특성이 상위 수준(전체 구조)에서 창발하는 것은 자기조직화 능력 때문이다. 자기조직화의 예로 모래언덕이 있다. 모래를 한 번에 한 개씩 떨어뜨려 언덕을 만들면 경사가 가파를수록 더 큰 사태가 일어나 많은 모래알이 아래로 흘러내린다. 위에서 떨어뜨리는 모래알과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래알이 평형을 이루는 임계 상태가 되면 모래언덕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모래언덕처럼 완전히 안정되지도 않고 완전히 무질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자기조직화라고 한다.[48][49]
4. 복잡계 과학과의 관계
창발성은 복잡계 과학의 기본 주제이다. 여기서 창발성은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구성원(개체)으로 형성된 계에서 발생하는, 계의 전역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써 시스템 이론에서 주로 사용된다. 복잡계 과학의 연구 대상은 사람의 뇌나 생태계같이 상호 관계가 중요한 현상이다. 이들을 통틀어 복잡계라고 부른다.[52]
복잡계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첫째, 단순한 구성 요소가 수많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가령 사람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주식 시장은 수많은 투자자들로 들끓는다. 둘째,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구성 요소를 재조직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응한다. 사람 뇌는 끊임없이 신경세포의 회로망을 재구성하면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한다.[52]
복잡계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발 현상을 보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잡계의 개념과 이론은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발전해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흔히 인용되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내리는 정의도 다양하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창발이 일어나기 위해 시스템이 갖춰야 하는 특징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53]
복잡성 과학은 1980년대에 등장한 풋내기 과학이며 장래가 반드시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자연 세계와 사회 현상이 복잡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창발의 원리를 밝히려는데 거는 기대는 상상 외로 크고 뜨거울 수밖에 없다.[55]
4. 1. 복잡계의 특징
복잡계는 축척에 따라 복잡성이 변화하며, 비선형적인 행동을 보인다. '축척이 작아진다'는 것은 더욱 가까이 접근하는 것, 즉 보다 미세한 부분까지 바라본다는 뜻이다. 축척이 원자와 분자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면 복잡성은 급격히 커진다.[54] 비선형 세계에서는 초기 조건에서 발생하는 작은 변화가 출력에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를 야기한다. 그러한 현상의 하나가 혼돈(카오스)이다. 그러나 복잡계는 혼돈 대신 질서를 형성해 낸다. 혼돈과 질서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52] 다시 말해서 혼돈계와 복잡계는 비선형이라는 점에서 같지만 혼돈계에는 혼돈이, 복잡계에서는 질서가 나타난다는 면에서 다르다.복잡계는 단순한 구성 요소가 상호간에 끊임없는 적응과 경쟁을 통해 질서와 혼돈이 균형을 이루는 경계면에서, 완전히 고정된 상태나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항상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낸다. 이를테면 단백질 분자는 생명체를, 기업이나 소비자는 국가 경제를 형성한다. 단백질 분자는 살아 있지 않지만, 그들의 집합체인 생물은 살아 있다.[52]
4. 2. 혼돈의 가장자리
생명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창발한다. 여기서 혼돈의 가장자리란 질서와 혼돈 사이에 완벽한 평형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한다.[52] 복잡계는 단순한 구성 요소가 상호간에 끊임없이 적응과 경쟁을 통해 질서와 혼돈이 균형을 이루는 경계면에서, 완전히 고정된 상태나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항상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낸다. 이를테면 단백질 분자는 생명체를, 기업이나 소비자는 국가 경제를 형성한다. 단백질 분자는 살아 있지 않지만 그들의 집합체인 생물은 살아 있다.[52]이처럼 혼돈과 질서를 분리시키는 극도로 얇은 경계선을 혼돈의 가장자리(edge of chaos)라 한다. 생명은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한쪽으로는 너무 많은 질서, 다른 한쪽으로는 너무 많은 혼돈 속으로 언제든지 빠져들 위험을 간직한 채 평형을 지키려는 유기체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혼돈의 가장자리는 복잡계 과학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다. 복잡계는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복잡한 행동을 창발함과 동시에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52]
5. 창발의 분류
창발은 크게 환원, 수반, 창발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환원: 더 복잡한 범주가 더 기본적인 범주의 부분이나 기초로 설명될 수 있으며, 더 기본적인 범주의 집합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 수반: 더 복잡한 범주가 더 기본적인 범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 수준의 더 복잡한 범주가 하위 수준의 더 기본적인 범주 위에 창발될 때 수반한다고 한다.
- 창발: 더 복잡한 범주는 더 기본적인 범주의 집합과 다르고, 더 복잡한 범주가 더 기본적인 범주보다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냄새는 수소나 질소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화학 법칙으로 예측할 수 없다.[42] 이는 조직의 일정 수준에서 실체에 속한 성질은 그보다 낮은 차원에서 발견된 성질로부터는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학적 입장에서 창발 개념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명확하게 발전했으며, 생명 현상의 정의와 특징화를 둘러싼 생기론자와 기계론자의 논쟁에서 기원한다.[42] 창발주의자는 생기론과 기계론 양쪽에 반대한다. 생기론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물질이나 힘, 앙리 베르그송이 제창한 "엘랑 비탈"과 같은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계론에 대해서는 생명체의 특성을 단순한 화학적·기계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리고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다"라고 주장한다.[42]
5. 1. 환원주의와 전체론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을 더 기본적인 요소로 설명하려는 입장이다.[56]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종이나 군집 수준의 현상은 그 수준에 특유의 법칙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나 개체 수준의 행동 및 법칙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56]반면, 전체론은 전체가 부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을 갖는다고 주장한다.[57] 이러한 성질을 전체성이라고 하며, 생명 현상의 전체성에 대한 주목은 생기론에서 시작되었다.[57] 현대의 전체론은 생명 현상에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원리가 있다고 보거나, 군집이나 종 같은 상위 수준의 현상은 개체나 유전자 같은 하위 수준에서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57]
6. 철학에서의 창발
철학에서 창발은 이전 단계에는 없던 성질이 상위 단계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수준으로의 환원 불가능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냄새는 수소나 질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화학 법칙으로도 예측할 수 없다.[42]
> "개개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것들이 상호 작용했을 때에 나타날 것으로 결코 예상하지도 못한 동작이 그야말로 창조적으로 발현되는 것" (John. L. Casti, 1997)
창발성은 정의에 따라 단순한 물리 법칙으로 나타낼 수 없다.[43] 또한 창발적 체계의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되먹임을 조작하는 일이 필요하며, 모든 창발적 체계는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촉진하는 쌍방향 연결되먹임으로부터 만들어진다.[44]
철학자들은 종종 창발을 체계의 속성에 대한 원인론적 주장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체계의 창발적 속성이란 체계를 구성하는 어떤 요소의 속성도 아니지만, 전체 체계의 특징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발에 관해 글을 쓴 최초의 현대 철학자 중 한 명인 니콜라이 하르트만은 이를 "범주적 노붐"(새로운 범주)이라고 칭했다.[1]
철학적 입장에서 창발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명확하게 발전했으며, 오랫동안 철학적 논쟁을 낳았다. 이 논의는 화학 철학과 고전 역학의 발달 속에서 생명 현상의 정의와 특징화를 둘러싼 생명론자와 기계론자의 논쟁에서 기원한다. 창발주의자는 생명론자와 기계론자 양쪽에 반대한다. 생명론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물질이나 힘, 앙리 베르그송이 제창한 "엘랑 비탈"(생명의 약동)과 같은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계론에 대해서는 생명체의 특성을 단순한 화학적·기계적 과정으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다"라고 주장한다.
6. 1. 아힘 슈테판의 창발
아힘 슈테판(Achim Stephan)은 창발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58]- '''약한 창발''': 물리적 일원론과 공시적 결정성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가진다.
- 물리적 일원론: 우주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물리적인 실재로 구성된다. 창발적 성질, 성향, 행동 양식, 구조는 물리적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의해서만 실현된다.
- 공시적 결정성: 시스템의 성질이나 행동 성향은 그것의 미시구조, 즉 구성 요소나 배열에 의존한다. 구성 요소나 배열에 차이가 없으면 시스템 성질에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약한 통시적 창발''': 약한 창발에 새로운 종의 명제가 추가되어 의미가 강화된 것이다.
- '''공시적 창발'''(강한 창발): 약한 창발에 환원 불가능성이 덧붙여진 것이다.
- '''통시적 구조-창발''': 로봇 공학이나 인공 생명 연구에 필요한 창발 형태로, 약한 통시적 창발에 구조적-불예측성 명제가 더해진 것이다.
7. 과학에서의 창발
과학에서 창발은 복잡한 모형의 과정, 단순한 규칙이나 원인으로부터 형성되는 결과를 의미하며, 환원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창발성은 정의에 따라 단순한 물리법칙으로 나타낼 수 없다.[43] 규칙만 알아서는 예측하거나 계산할 수 없고, 계를 작동시켜야 알 수 있다.[46]
창발성은 복잡계 과학의 기본 주제이다. 복잡계는 단순한 구성 요소가 수많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질서와 혼돈의 균형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 이러한 복잡계의 창발적 운동은 예측할 수 없으며, 개별 성분의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다.[52] 복잡계는 축척에 따라 복잡성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며, 축척이 커지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창발이다.[54] 복잡계는 혼돈(카오스)과 달리 질서를 형성하는 능력이 있으며,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생명이 창발한다. 복잡계는 이 가장자리에서 가장 복잡한 행동을 창발하고 환경에 잘 적응한다.[55]
물리학에서 창발은 미시적 규모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거시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속성, 법칙 또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12][13] 거시적 시스템이 미시적 시스템의 매우 큰 앙상블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타난다. 로버트 러플린에 따르면, 다체계의 경우 미시적 방정식으로부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거시적 시스템은 대칭성 파괴로 특징지어진다. 미시적 방정식에 존재하는 대칭성은 상 전이로 인해 거시적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14]
아서 쾨슬러는 야누스의 은유를 사용하여 강한 창발과 약한 창발(전체론 대 환원론)을 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창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설명했다. 필립 앤더슨은 "모든 것을 간단한 기본 법칙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한 법칙에서 시작하여 우주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각 복잡성 수준에서 완전히 새로운 속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14]
재규격화군과 같은 이론 물리학의 방법은 물리학자들이 부분의 조합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임계 현상을 연구할 수 있게 한다.[15] 2009년, 구(Gu) 등은 계산 불가능한 거시적 속성을 나타내는 무한 물리 시스템의 종류를 제시했다.[16][17]
임의의 배열을 가진 이진(RC) 전기 네트워크의 대량 전도 응답은 보편적 유전체 응답(UDR)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시스템의 창발적 속성으로 볼 수 있다.[36] 인터넷 트래픽 또한 겉보기에 창발적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혼잡 제어 메커니즘에서 TCP 흐름은 병목 지점에서 전역적으로 동기화되어 처리량을 동시에 증가시킨 다음 감소시킬 수 있다. 널리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혼잡은, 높은 트래픽 흐름에서 네트워크 전체에 병목 현상이 확산되는 현상의 창발적 속성일 수 있으며, 이는 상전이로 간주될 수 있다.[37]
7. 1. 자연에서의 창발
자연에서의 창발은 비생명적 창발과 생명적 창발, 생태학적 창발로 나눌 수 있다.[59][60]비생명적 창발은 적응이 없는 창발적 복잡성을 나타낸다. 복잡한 눈송이 결정, 구름, 폭풍우 등이 그 예시이며, 이들은 일차 원리로부터 계산해낼 수 없고 복잡계의 창발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59]
물리학에서 창발은 미시적 규모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거시적 규모(공간 또는 시간)에서 발생하는 속성, 법칙 또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거시적 시스템이 미시적 시스템의 매우 큰 앙상블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타난다.[12][13]
> 물리 시스템의 창발적 행동은 미시적 구성 요소의 수가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질적 속성이다.[14]
생명은 창발 현상의 덩어리이다. 앨런 튜링은 동물의 체표에 나타나는 줄무늬나, 식물이 그리는 타이거 부시, 페어리 서클 등의 현상을, 언뜻 상관이 없는 듯한 조직이나 개체의 생명 활동의 결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튜링 패턴)[61] 또한, 뇌는 하나하나의 신경 세포는 비교적 단순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로부터 아직 뇌 전체가 가진 지능을 이해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나 교차에 의한 유전자 조합으로 뜻밖의 능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개의 개체에 의한 상호 작용 외에도,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도 더해진다.[61]
7. 1. 1. 생명적 창발
흰개미는 역할에 따라 여왕개미, 수개미, 병정개미, 일개미로 발육하여, 수만 마리씩 큰 집단을 이루고 질서 있는 사회를 형성한다. 흰개미는 흙이나 나무를 침으로 뭉쳐서 집을 짓는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버섯흰개미는 높이가 4m나 되는 탑 모양의 둥지를 만들 정도이다. 이 집에는 온도를 조절하는 정교한 냉난방 장치가 있으며, 애벌레에게 먹일 버섯을 기르는 방까지 갖추고 있다.[60]개개의 개미는 집을 지을 만한 지능이 없다. 그럼에도 흰개미 집합체는 역할이 상이한 개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탑을 만든다.[60]
7. 1. 2. 생태학적 창발
현대 생태학에서는 생태계 내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성질, 즉 창발성을 중시한다. 이는 기후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자연의 균형이 깨진 결과라는 전통적인 관점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60]생태계에서는 하위 계층의 구성원들이 모여 상위 계층을 형성할 때, 하위 계층에는 없던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기능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창발성이라고 한다.[60]
하와이 고지에서 외래종이 정착에 실패한 사례는 생태계의 창발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다양한 종으로 구성된 생태계는 종 간의 협력을 통해 외부 경쟁자를 배척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외래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 즉, 외래종을 물리치는 것은 개별 종의 능력이 아닌 생태계 전체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60]
7. 1. 3. 자연과 창발주의
창발주의는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지식이 경험적인 한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2]7. 1. 4. 창발적 진화
창발적 진화(Emergent evolution영어)는 물질에서 생물로,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61] 수소와 산소가 화합하여 물이 생기는 경우처럼, 각각의 것의 결합에 의해 새로운 성질이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기초로 한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원리를 진화이론에 적용한 것으로 조어이며, 변증법을 자연계에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61]여러 창발론자들은 사고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창발의 또 다른 의미인 ‘기존하는 것의 전개’라는 관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창발의 기초에 지구상의 원초적 물질 중에 이미 생명을 향한 막연한 방향성이 존재한다거나, 혹은 생명이 창발하는 물질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규정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창발적 진화학자들은 '창발적 전체' 또는 '통합적 전체'를 주장하는데, 이는 부분적 결합에 의해 새로운 성질을 갖는 전체가 출현하는 것으로 자기완결성을 가진다. 오래전에는 군집의 유기적 총체로 성질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구성요소 간 상호 작용이 다수 결합된 네트워크 시스템을 다루는 수리 분야에서는 각각의 관계가 겹쳐서 예측할 수 없는 전체 거동의 출현이 주목받는다.[61]
생명은 창발 현상의 덩어리이다. 동물의 체표에 나타나는 줄무늬나, 식물이 그리는 타이거 부시, 페어리 서클 등의 현상은, 언뜻 상관이 없는 듯한 조직이나 개체의 생명 활동의 결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 앨런 튜링의 가설(튜링 패턴)로 알려져 있다. 뇌는 하나하나의 신경 세포는 비교적 단순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로부터 아직 뇌 전체가 가진 지능을 이해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진화론에서는 돌연변이나 교차에 의한 유전자 조합으로 뜻밖의 능력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진화론에서는 개개의 개체에 의한 상호 작용 외에도,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도 더해져 있다.[61]
7. 1. 5. 생명의 조직화
세포의 형질은 복잡계의 창발성과 유사하며, 계산으로 포착하기 어렵다. 인간과 같은 다세포생물은 약 100조 개의 세포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각 단계는 상하위 단계에 의존하여 더욱 복잡하다. 몸은 기관, 기관은 조직, 조직은 세포, 세포는 세포소기관, 그리고 분자 단계로 이어진다. 이 단계들 사이에는 정보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복잡성의 특정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물은 구름이나 난류처럼 다양한 규모에 걸쳐 구조를 나타낸다.[62]7. 2. 정보과학에서의 창발
창발성을 응용하는 기술은 사용자에게 친숙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넘어, 대중매체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구분하는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63]위 동영상은 격자 무늬로 되어 있으며, 각 격자(세포 자동자)는 모두 동일하며, 다음 3가지 단순한 규칙만으로 작동한다.
- '''탄생''': 흰색 셀 주위에 3개의 검은색 셀이 있으면 다음 순간에 그 셀은 검은색이 된다.
- '''유지''': 검은색 셀 주위에 2개 또는 3개의 검은색 셀이 있으면 다음 순간에도 그 셀은 검은색으로 남는다.
- '''사망''': 위의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다음 순간에 그 셀은 흰색 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요소(여기서는 검은 점)가 불과 수십 개 존재하더라도 창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발 현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공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군집 지능 등이 있다.
7. 2. 1. 인터넷의 사례
웹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형태의 인공 자기조직화 체제이다.[64] 네트워크 과학은 인체, 인터넷, 인간관계 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바라보고 공통점을 발견하려는 학문으로, 물리학,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복잡한 세상을 네트워크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본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과학은 복잡성 과학에 포함된다. 복잡성 과학의 근본 목적은 복잡한 체계 내에서 의미 있는 질서가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즉 창발의 원리를 밝히는 것이다. 네트워크 과학은 복잡성 과학과 마찬가지로 시작 단계이며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네트워크 과학의 연구 주제는 광범위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전체의 활동이 창발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64]인터넷 트래픽은 창발적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혼잡 제어 메커니즘에서 TCP 흐름은 병목 지점에서 전역적으로 동기화되어 처리량을 동시에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킬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문제인 혼잡은 높은 트래픽 흐름에서 네트워크 전체에 병목 현상이 확산되는 현상의 창발적 속성일 수 있으며, 이는 상전이로 간주될 수 있다.[37]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발 현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인공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군집 지능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웹을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창발 시스템으로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 2. 2. 창발적 소프트웨어
사실상 최초의 창발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셀프리지가 설명한 상향식으로 학습하고 평가를 위해 되먹임 순환을 이용하는 체계이다.[65] 1980년대 중반 UCLA의 두 교수 데이비드 제퍼슨과 척 테일러는 실제 세계의 생물체에서 발견되는 창발적 지능의 진화를 모형화하고 이해하기 위해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66]심시티는 창발성의 신비한 상향식 힘을 이용한 최초의 게임 중 하나이다. 심시티는 기존의 게임들처럼 시합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용자는 가상 도시를 키우지만 도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도시의 형태는 항상 간접적으로밖에 통제되지 않는다.[67]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발 현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공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군집 지능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웹을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창발 시스템으로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7. 2. 3. 창발성의 응용
네오기관은 조직공학의 한 분야로, 생체 분해성 중합체와 사람 세포를 이용해 인체 조직이나 기관을 만드는 기술이다.[69] 인공생명은 생명을 구성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한 집합체로부터 출현하는 현상으로 설명한다.[70]임의의 배열을 가진 이진(RC) 전기 네트워크의 대량 전도 응답은 보편적 유전체 응답(UDR)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시스템의 창발적 속성으로 볼 수 있다.[36] 인터넷 트래픽 또한 겉보기에 창발적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혼잡 제어 메커니즘에서 TCP 흐름은 병목 지점에서 전역적으로 동기화되어 처리량을 동시에 증가시킨 다음 감소시킬 수 있다. 널리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혼잡은 높은 트래픽 흐름에서 네트워크 전체에 병목 현상이 확산되는 현상의 창발적 속성일 수 있으며, 이는 상전이로 간주될 수 있다.[37]
위의 동영상은 격자 무늬로 되어 있으며, 각 격자(= 세포 자동자)는 모두 동일하며, 모두 다음 3가지 단순한 규칙만으로 작동한다.
- '''탄생''': 흰색 셀 주위에 3개의 검은색 셀이 있으면 다음 순간에 그 셀은 검은색이 된다.
- '''유지''': 검은색 셀 주위에 2개 또는 3개의 검은색 셀이 있으면 다음 순간에도 그 셀은 검은색으로 남는다.
- '''사망''': 위의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다음 순간에 그 셀은 흰색 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요소(여기서는 검은 점)가 불과 수십 개 존재하더라도 창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부 인공 지능(AI)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은 창발적 행동을 시뮬레이션한다.[38] 한 예로, 새의 떼 지어 다니는 행동을 모방한 보이드가 있다.[39]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창발 현상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인공 신경망, 유전 알고리즘, 군집 지능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웹을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창발 시스템으로 재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8. 사회에서의 창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 신드롬은 창발의 한 예이다.[45] 한국 대표팀의 연이은 승리와 길거리 응원 모습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경기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붉은색에 대한 이념적 편견을 극복할 정도였다.[71] 이처럼 응원 인파는 하나의 복잡계였다.
인간은 사회 시스템의 기본 요소이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유대를 만들거나 유지, 해체한다. 사회 시스템 내 사회적 유대는 구조의 지속적인 재구성을 의미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18]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사회적 형성의 출현에 대한 초기 논쟁을 제시했다.[19] 최근에는 여러 상호작용 단위 간 비선형적 관계에서 질서가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사회 시스템 출현과 관련있다고 본다. 여기서 상호작용 단위는 개별적인 생각, 의식, 행동을 뜻한다.[20]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성장, 축적, 혁신이 기술적 프로세스를 통해 재귀적이고 자기 확장적인 나선형으로 추가 혁신의 원천이 되는 창발적 과정으로 보았다.[21] 그는 농업 기반 경제에서 산업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과 자연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추적하며, 이 변화가 자기 조절 시장이라는 개념과 함께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위한 무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22]
탈성장과 사회적 생태 경제학은 인간의 웰빙이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것을 극복하는 변환에 대해 이론화하기 위한 공진화적 관점을 옹호한다.[23][24]
조직 관리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 창발 현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적절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8. 1. 도시의 자기조직화
도시는 상향식 힘이 도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창발적 지능을 가진 초유기체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경제학자와 도시사회학자들은 도시 모델을 통해 자기조직화 과정을 연구해 왔다. 실제 도시 형성에 있어서는 구역 설정 법규나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하향식 강제력이 작용하지만,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상향식 힘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근린(近隣)들과 무계획적인 인구 집단들을 만들어내는 등 도시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해 왔다.[72]
도시라는 초유기체가 다른 사회적 형태를 제치고 성공한 이유는 일종의 창발적 지능, 즉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며 인간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덕분이다. 인간은 이러한 창발적 지능에 기여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73]
8. 1. 1. 대도시의 보도 정보망
제인 제이콥스는 "대도시란 크기만 커진 마을이 아니고 인구밀도만 높아진 교외도 아니다. 대도시란 마을이나 교외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다"라고 하였다.[72]보도는 도시 시민들 사이에서 정보가 오가는 주요 통로이다. 주민들은 보도 위에서 이웃들과 마주치고 그들의 상점과 집을 지나가면서 정보를 얻는다. 보도에서는 완전한 타인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높은 대역의 통신이 이루어지며 수많은 개인들이 혼합되어 무작위적인 형태를 이룬다. 보도가 없다면 도시는 후각이 없는 개미 또는 일개미가 너무 적은 개미 집단과 같을 것이다. 보도는 적절한 종류와 적절한 수의 국지적 상호작용을 제공한다. 보도는 도시 생활의 간극을 잇는 연접부이다. 이것은 창발성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어떤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면 그 문제와 과거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보이는 하나의 예이다.[74]
8. 2. 방송에서의 창발
플라워스 사건은 창발적 체계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플라워스 사건은 중앙기관의 명령 없이 국지적 행위자들이 거시 행동을 형성하는 창발성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75]8. 3. 정치에서의 창발
진보적 운동은 자기조직화 체제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집단 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반대하며, 변화에 잘 적응한다. 이러한 특징은 진보적 운동이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적인 관점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다.[76]세계무역기구(WTO) 반대 운동은 창발성이 진보적 운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이 운동은 분산된 세포 구조를 가진 자기조직화 체제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76]
막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사회적 형성의 출현에 대한 초기 논쟁을 제시했다.[19] 최근에는 여러 상호 작용 단위 간의 비선형적 관계에서 질서가 나타나는 현상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상호 작용 단위는 개별적인 생각, 의식, 행동을 의미한다.[20]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하의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성장, 축적, 혁신이 기술적 프로세스를 통해 재귀적이고 자기 확장적인 나선형으로 추가 혁신의 원천이 되는 창발적 과정으로 보았다.[21] 그는 농업 기반 경제에서 산업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과 자연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이러한 변화가 자기 조절 시장이라는 개념과 함께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22]
탈성장과 사회적 생태 경제학은 인간의 웰빙이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것을 극복하는 변환에 대해 이론화하기 위한 공진화적 관점을 옹호한다.[23][24]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조직 구성원 간의 창발 현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결합하여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9. 예술에서의 창발
예술 분야에서도 창발 개념이 활용된다.
마이클 J. 피어스는 현대 신경과학과 관련된 예술 작품을 경험을 설명할 때 창발을 사용했다.[40] 실천 예술가 레오넬 모라는 "아트봇"에 비록 초보적 수준이지만 창발적 원리에 기반한 진정한 창의성을 부여한다.[41]
9. 1. 문학에서의 사례
그레이 구 시나리오는 자기증식 나노기계가 지구 전체를 뒤덮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에릭 드렉슬러는 이러한 상태를 잿빛 덩어리(grey goo)라고 명명했다. 2002년 마이클 크라이튼은 드렉슬러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소설 Prey|먹이영어를 발표하여 그레이 구 시나리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였다. 크라이튼은 소설에서 자기증식 로봇이 집단을 형성하면 떼 지능이 창발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이러한 나노봇 떼는 빠르게 변형되어 이미지, 소리, 사람의 윤곽 등을 투영할 수 있다고 한다.[77]9. 2. 영화에서의 사례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 로봇(2004)에서는 로봇의 모의 지각력이 합쳐져 창발하여 로봇의 고스트가 형성되고, 로봇도 진화할지 모른다는 설정이 등장한다.참조
[1]
서적
Possibility and actuality
https://doi.org/10.1[...]
Walter De Gruyter
2013
[2]
서적
Metaphysics (Aristotle)
[3]
서적
The Routledge Handbook of Emergence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20-10-25
[4]
문서
The chemical combination of two substances produces, as is well known, a third substance with properties entirely different from those of either of the two substances separately, or of both of them taken together.
[5]
문서
1947
[6]
서적
Problems of Life and Mind
https://books.google[...]
Osgood
2019-03-24
[7]
문서
Strong and Weak Emergence
http://consc.net/pap[...]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8]
서적
The Emergence of Life: From Chemical Origins to Synthetic Biology
http://www.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학술지
Emergence: Core ideas and issues
[10]
학술지
The Calculi of Emergence: Computation, Dynamics, and Induction
http://csc.ucdavis.e[...]
2019-03-24
[11]
문서
The mystery of time
2017
[12]
서적
Basic Notions Of Condensed Matter Physics
https://books.google[...]
CRC Press
2018-03-09
[13]
서적
Modern Condensed Matter Physic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02-28
[14]
학술지
Defining Emergence in Physics
Nature Research
[15]
학술지
From bottom-up approaches to levels of organization and extended critical transitions
2012-01-01
[16]
학술지
More really is different
[17]
학술지
Computation: The edge of reductionism
[18]
서적
Social system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
학술지
Elective affinities of the Protestant ethic: Weber and the chemistry of capitalism
http://aura.abdn.ac.[...]
[20]
서적
Complexification: Explaining a paradoxical world through the science of surprise
Harper Collins
[21]
학술지
Degrowth: Tools for a Complex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Crisis
http://www.tandfonli[...]
2024-04-10
[22]
서적
The Great Transformation
1944
[23]
학술지
A tale of three paradigms_ Realising the revolutionary potential of ecological economics
2020
[24]
서적
Another Economy is Possible: Culture and Economy in a Time of Crisis
Wiley
2017
[25]
학술지
Complexity and the economy
[26]
학술지
Engaging Emergence: Turning Upheaval into Opportunity
http://peggyholman.c[...]
2010-12-01
[27]
서적
Empowerment on an Unstable Planet: From Seeds of Human Energy to a Scale of Global Change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8]
서적
Presence: exploring profound change in people, organizations, and society
Brealey
2012
[29]
학술지
An essay on ready-ing: Tending the prelude to change
https://onlinelibrar[...]
2022-09-01
[30]
학술지
Aphanipoiesis
https://journals.iss[...]
2021
[31]
서적
Theory U: leading from the future as it emerges: the social technology of presencing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a BK Business Book
2016
[32]
서적
Emergent Strategy
AK Press
2017
[33]
학술지
L'émergence du style. Les méthodes stylométriques pour la recherche de paternité des textes médiévaux
https://www.academia[...]
[34]
서적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 Cognitive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structure
1998
[35]
학술지
Kielitieteen emergenttinen metateoria
https://journal.fi/v[...]
2022-03-24
[36]
논문
The origin of power-law emergent scaling in large binary networks
[37]
문서
관련 연구 검토
[38]
논문
Social behaviour as an emergent property of embodied curiosity: A robotics perspective
[39]
논문
Life as an emergent phenomenon: Studies from a large-scale boid simulation and web data
[40]
서적
Art in the Age of Emergence
http://www.cambridg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41]
논문
Robot Art: An Interview with Leonel Moura
2018-07-16
[42]
웹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창발성
https://terms.naver.[...]
[43]
서적
거의 모든 것의 미래
리더스 북
[44]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45]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46]
서적
거의 모든 것의 미래
리더스 북
[47]
서적
미래교양사전
임프린트 갤리온
[48]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49]
서적
이머전스-미래와 진화의 열쇠
김영사
[50]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51]
서적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52]
서적
이머전스-미래와 진화의 열쇠
김영사
[53]
서적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54]
서적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55]
서적
미래교양사전
임프린트 갤리온
[56]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57]
웹사이트
https://terms.naver.[...]
[58]
논문
심리 철학과 인지 과학에서 창발 개념의 역할에 대하여: 심리 철학과 인지 과학에서 필요로 하는 창발의 형태
[59]
서적
거의 모든 것의 미래
리더스 북
[60]
서적
미래교양사전
임프린트 갤리온
[61]
서적
생명과학대사전
아카데미서적
[62]
서적
거의 모든 것의 미래
리더스 북
[63]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64]
서적
미래교양사전
임프린트 갤리온
[65]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66]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67]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68]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69]
서적
미래교양사전
임프린트 갤리온
[70]
서적
미래교양사전
임프린트 갤리온
[71]
서적
복잡계 개론
삼성경제연구소
2005
[72]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2004
[73]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2004
[74]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2004
[75]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2004
[76]
서적
이머전스
김영사
2004
[77]
서적
미래교양사전
임프린트 갤리온
200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