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유진오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과 대한민국 헌법 제정, 교육 및 정치 활동을 거친 인물이다. 1906년 한성부에서 태어나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문학 활동을 했으며, 광복 후 헌법 기초, 법제처장,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장을 맡았고, 신민당 대표최고위원과 총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헌법해의》, 《유진오 단편집》 등이 있으며, 친일 행적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1987년 사망 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제강점기의 법학자 - 윤치영
윤치영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활동하며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제헌 국회의원, 초대 내무부 장관, 주프랑스 공사, 서울특별시장, 국회의장 등을 지냈으나, 친일 의혹과 독재 정권 옹호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일제강점기의 법학자 - 유길준
유길준은 조선 후기 개화 사상가이자 정치가, 언론인으로, 서구 문물을 접한 후 갑신정변 연루, 갑오개혁 참여, 아관파천 이후 망명, 애국계몽운동 전개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나, 근대화에 기여했음에도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도 있는 인물이다. - 대한민국의 법제처장 - 박일경
박일경은 일제강점기에 학위를 받고 함평군수, 서울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법제처장, 문교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 대한민국의 법제처장 - 송종의
송종의는 1941년 평안남도 중화군 출생의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요직을 역임하고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베트남 전쟁 참전, 밤나무 심기, 천고법치문화재단 설립 등의 활동을 했으나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재,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거부 등 여러 논란에도 연루되었다. - 국민의당 (1963년) 당원 - 김종인
김종인은 5선 국회의원과 장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했으나 뇌물수수 전력과 국보위 참여 경력 등으로 논란이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이다. - 국민의당 (1963년) 당원 - 이호 (법조인)
이호는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 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주일본 대사 등을 역임하고 12·12 군사 반란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지냈다.
| 유진오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兪鎮午 |
| 한글 이름 | 유진오 |
| 한자 이름 | 兪鎭午 |
| 일본어 히라가나 | ゆちんご |
| 일본어 가타카나 | ユ・ジノ |
| 출생일 | 1906년 5월 13일 |
| 출생지 | 대한제국 한성부 |
| 사망일 | 1987년 8월 30일 |
| 사망지 | 서울특별시 |
| 별칭 | 호 현민(玄民) |
| 학력 | |
| 출신 학교 | 경성제국대학 |
| 전공 | 법학 |
| 학위 | 학사 |
| 직업 및 활동 | |
| 주요 관심 분야 | 법학, 정치학 |
| 근무지 | 경성제국대학, 고려대학교, 학술원 |
|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총장, 신민당 총재, 헌법기초위원회 위원, 초대 법제처장, 한일회담 대표, 국정자문회의 위원, 국토통일원 고문, 작가, 교육인, 법조인, 정치인 |
| 종교 | 유교(성리학) → 개신교(장로회) → 천주교(세례명 : 토마) |
| 가족 관계 | |
| 배우자 | 성진순(사별), 박복례(사별), 이용재(삼혼) |
| 친척 | 이명래(장인), 한홍구(외손자) |
| 공직 정보 | |
| 정당 | 무소속 |
| 장관 | 이인 법무부장관 |
| 부통령 | 이시영 |
| 임기 | 1948년 8월 4일 ~ 1949년 6월 4일 |
| 직책 | 법제처장 |
| 대통령 | 이승만 |
| 국가 | 대한민국 |
| 총리 | 이범석 |
| 사령관 | 존 리드 하지 미군정청 군정사령관 |
| 이미지 | |
 | |
2. 생애
현민 유진오는 1906년 5월 13일 한성부에서 궁내부 제도국 참사관을 지낸 유치형(兪致衡)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기계이다.[1] 1914년 경성 재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8년 졸업했다. 1919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 1924년 졸업했으며, 같은 해 10월 성진순과 결혼하였다.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 예비시험 격으로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이 공동으로 치른 '제1회 대학예과 고등학교 입학 모의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8] 같은 해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예과로 입학한다. 입학 후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학생 모임인 ‘문우회’를 조직하고 회보 ‘문우’를 발간했다. 성인이 된 뒤 아호를 현민(玄民)이라 하였다.
1926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마치고 법문학부 법과에서 수강했고, 1931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내 좌익 성향의 학내 모임인 경제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이때 일제로부터 불령선인으로 감시당했으나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192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를 수석으로 졸업한다.
1926년 부인 성씨가 별세하자 1928년 박복례와 재혼하였다. 그러나 박복례 역시 사망하여 이명래의 딸 이용재와 재혼한다. 1929년 4월부터 1933년 3월까지 모교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로 있으면서 경성제대 예과에 강사로 나갔다.
1945년 광복 직후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를 겸하였으나 사퇴하였다. 해방 이후 언론에 헌법과 관련된 글을 발표함으로써 헌법 문제에 대한 입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1] 1945년 8월 16일 임화의 부탁으로 문인 회합에 나갔다가 이태준의 항의로 쫓겨난 뒤, 작가의 길을 접고 교육, 법,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조선인민공화국의 헌법 제정 작업 요청을 받았으나, 진주군이 인정한 권력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한민당의 요청은 수락하였다. 1945년 10월 이승만 귀국 후, 신익희가 구성한 '행정연구회'에 참여하여 헌법 제정 작업을 준비하며 미국, 이승만, 한민당 계열 인맥을 활용, 입지를 강화했다.[1] 1946년 변호사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정법대학장이 되었다. 1946년 미군정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헌법 분과위원)을 역임했다.[1]
광복 이후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였고(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초안을 기초했지만, 이승만에 의해 대통령제로 개정됨) 경성대학,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자로 활동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항마로 민중당(1965)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윤보선이 이끄는 신한당과의 단일후보 추대를 이유로 사퇴했다. 1967년 민중당과 신한당이 통합한 신민당 대표위원, 1968년 당 총재가 되었다. 1969년 민주공화당이 추진한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었으나, 1969년 10월 과로로 입원, 1970년 1월 총재직을 사퇴했다.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고문, 1980년 국토통일고문회의 고문,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했다. 1981년 대한민국학술원 원로회원(헌법)이 되었다.[1]
2. 1. 일제강점기
1926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률을 공부했다. 이 무렵 이광수를 만났고, 학우들과 경제연구회를 조직했다.[1] 처음에는 경제 서적 강독 모임이었지만, 김대준, 이강국, 박문규 등이 가입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띠게 되었다.[1] 수년 후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 관련 인물까지 참여하면서 경제연구회는 대학 당국에 의해 해산되었다.[1]1927년 조선지광에 단편소설 ‘스리’를 발표하며 작가로 등단했다.[9] 1929년 경성제국대학 졸업 후 조선인 졸업생 모임 ‘낙산구락부’를 조직, 학술잡지 ‘신흉’을 발간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관심을 기울여 오월의 구직자한국어, 여직공한국어, 가정교사한국어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동반자 작가로 주목받았으나, KAPF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1930년 '이지휘'라는 필명으로 '년간조선사회운동개관'을 동아일보에 기고했다.[9] 같은 해 만주 여행 후 마적, 귀향, 송군남매와 나 등 동반자적 경향이 짙은 작품을 발표했다.[9]
1932년 근로 대중을 위한 연극을 표방하는 극단 메가폰을 결성했다. 같은 해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면서 법학과 강사로 출강했고, 이후 국제법과 국제정치 관련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1933년 보성전문학교 법학과 전임강사에 임용되었고, 동아일보 객원기자로 칼럼을 기고했다.[9]
1936년 원산청년회 강연 내용이 반일적이라는 이유로 총독부 경무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보성전문학교 정교수로 임용되었다.[9]
1937년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부임, 1939년 법과 과장을 맡았다. 같은 해 법학 연구를 중단하고 창작활동에 몰두, '유진오단편집'을 간행했다.[9]
1939년 삼천리에 중일 전쟁을 지지하는 사설을 기고하며 친일 행적이 시작되었다. 조선문인협회, 조선문인보국회, 조선임전보국단 등 총독부 어용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고,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선전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9]
1940년 7월 '삼천리'에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대륙의 전선에 분전하는 용사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금차 도지(渡支)하는 제위의 건강을 빌며 이 중대한 사명을 무사히 다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에 가담하였다.[9]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 문학 활동과 시국 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조선 청년들의 학병 지원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하였다.
2. 1. 1. 출생과 학창 시절
현민 유진오는 1906년 5월 13일 한성부에서 궁내부 제도국 참사관을 지낸 유치형(兪致衡)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기계이다.[1] 1914년 경성 재동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18년 졸업했다. 1919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 1924년 졸업했다. 1919년 10월 성진순과 결혼하였다.같은 해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 예비시험 격으로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이 공동으로 치른 '제1회 대학예과 고등학교 입학 모의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8] 같은 해 경성제국대학 예과 입학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하여 예과로 입학한다. 입학 후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인학생 모임인 ‘문우회’를 조직하고 회보 ‘문우’를 발간했다. 성인이 된 뒤 아호를 현민(玄民)이라 하였다.
1926년 3월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마치고 법문학부 법과에서 수강했고, 그해 4월 이후부터 1931년까지 경성제국대학 내 좌익 성향의 학내 모임인 경제연구회의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이때 일제로부터 불령선인으로 감시당했으나 무사히 학교를 마치고 1929년 3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과를 수석으로 졸업한다.
1926년 부인 성씨가 별세하자 1928년 박복례와 재혼하였다. 그러나 박복례 역시 사망하여 이명래의 딸 이용재와 재혼한다. 1929년 4월부터 1933년 3월까지 모교인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수로 있으면서 경성제대 예과에 강사로 나갔다.
2. 1. 2. 작가 및 교육 활동
1927년 5월 단편소설 ‘스리’를 조선지광에 발표하면서 작가로 등단했다.[9] 1929년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조선인 졸업생 모임인 ‘낙산구락부’를 조직하여 학술잡지 ‘신흉’을 발간했다.1930년 이지휘란 필명으로 당시 운동의 상황과 문제점을 정리한 '년간조선사회운동개관'을 동아일보에 기고했다.[9] 같은 해 만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후 마적, 귀향, 송군남매와 나 등의 동반자적 경향이 짙은 작품을 발표했다. 당시 KAPF에서 가입 권고를 받았으나 그는 카프가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을 등한시한다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었다.[9]
1932년 5월을 전후해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한 연극을 표방하는 극단 메가폰을 결성했다. 같은 해 김성수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면서 법학과 강사로 출강했고, 이후 국제법과 국제정치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했다. 1933년 4월 보성전문학교 법학과 전임강사에 임용되었고, 10월부터 동아일보의 객원기자로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1936년 함경남도 원산청년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반일적 사상을 담고 있다는 문제가 되어 총독부 경무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같은 해 4월 보성전문학교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1937년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1939년 보성전문학교 법과 과장 직을 맡았다. 같은 해 법학 연구를 중단하고 창작활동에 몰두했다.[9] 이 해 '유진오단편집'이 간행되었다.
1932년부터 보성전문학교에서 법과 강사로 출강하며 국제법과 국제정치에 관한 논문을 몇 편 발표했다. 1933년 4월부터 같은 학교 전임 강사가 되었고, 1937년에는 교수로 승진했다.[1]
학생 시절이던 1927년에 조광에 단편 스리한국어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했다. 이후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관심을 기울여 오월의 구직자 (五月の求職者)한국어, 여직공 (女職工)한국어, 가정교사 (家庭教師)한국어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한때 동반자 작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문학 작가들이 모두 KAPF 조직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오는 프롤레타리아 성향의 작품을 쓰면서도 KAPF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유진오는 문학과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KAPF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프롤레타리아 작가이면서도 1931년과 1934년의 KAPF 일제 검거 때 유진오는 체포를 면했다.
그러나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 유진오도 작품의 지향성을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 이기영, 김남천, 한설야 등 많은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써야 할 주제를 잃은 가운데, 유진오 또한 그 주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태준, 정지용, 이효석 등과 함께 순수 문학을 모색하며 김강사와 T교수 (金講師とT教授)한국어 (일본어 번역본은 이와나미 문고 『조선 단편 소설선』에 수록) 등을 발표했다.
2. 1. 3. 친일 행적
1939년 7월 삼천리에 중일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사설을 기고하면서 친일 행적이 시작되었다. 조선문인협회, 조선문인보국회, 조선임전보국단 등 총독부 어용단체에 가입해 활동했고, 1940년에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와 선전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9]같은 해 7월 '삼천리'에 "동아신질서 건설을 위하여 대륙의 전선에 분전하는 용사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금차 도지(渡支)하는 제위의 건강을 빌며 이 중대한 사명을 무사히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란 실로 인간의 가장 심오한 금선(琴線)을 울리는 가장 절실한 인간 활동이라 금차의 제위의 전선 위문은 반드시 위대한 문학적 성과로 나타날 것을 아울러 기대합니다."라며 '북지황군(北支皇軍) 위문단'을 격려하는 '신질서 건설과 문학'이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활동에 가담하였다.[9]
1939년 10월 조선실업구락부에 가입했다. 11월 3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외곽 지지단체인 조선문인협회가 경성에서 결성될 때 발기인과 간사로 참여했고, 11월 8일 조선문인협회가 주최한 '전선(戰線)에 위문문·위문대 보내기 행사'를 주관했다.[9] 12월에는 조선문인협회 간사로서 사업부 조직 임무를 맡았다.[9]
1940년 2월 조선문인협회가 주최한 평양문예대회에서 '조선문학과 요어 문제'라는 연제로 대중강연을 했다.[9] 9월 만주국 민생부(民生部) 주최 만주문화건설공작강연회(滿州文化建設工作講演會)에서 '조선문학과 만주 문학-특히 현대 조선의 입장으로부터'라는 연제로 만주국 순회강연을 했다. 10월 12일 조선문인협회 주최 문사부대(文士部隊) 육군지원병훈련소 1일 입소에 참여한 뒤 '삼천리' 12월호에 '일사불란의 그 훈련'이라는 짧은 산문을 통해 "지원병훈련소를 견학하고 그 질서와 규율에 다시금 탄복하였다. 공교로이 그날 오후 나는 불가피한 사무가 있어 훈련의 실상은 견학하지 못하였으나 숙사 학교 식사 등의 실경을 보았을 때 그 질서의 정연함에 탄복하였다. 그 일사불란의 훈련 속에서 동아신질서 건설의 굳센 힘도 우러나올 것으로 믿는다."라는 소감을 밝혔다.[9] 11월부터 12월까지 조선문인협회 주최 순회 시국강연회 연사로 평안도에 파견되어 '신체제와 국어보급'이라는 연제로 강연했다.[9] 12월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와 선전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1월 25일에는 김동환, 박영희 등과 함께 시국강연회에 참가했다.
1941년 2월 제1회 조선예술상 문학부문 심사위원을 맡았고, 매일신보사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문화익찬의 반도체제- 금후 문화부 활동을 중심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했다.[9] 7월 조선문인협회 주최 용산 호국신사 어조영지 근로봉사(護國神社御造營地)에 참여했다.[9] 8월 조선문인협회 상무간사를 맡았다.[9]
1941년부터 1945년 일제 패망까지 각종 시국 강연에 참석해 시국 연설을 하는 등 친일 성향의 논조 사설들을 게재했다.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에 위촉되었고, 같은 해 8월 12일 열린 문인협회 간부회의에서 김동환, 박영희 등과 함께 상무간사로 위촉되었다. 친일잡지 '삼천리' 등에 친일 논문을 실었고[12], 학병 지원 권유와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역설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에는 조선임전보국단이라는 단체가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결합되었는데, 조선임전보국단은 1941년에 조선 문학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최린(崔鱗), 김동환 계열의 임전대책협의회와 윤치호(尹致昊) 계열의 흥아보국단이 통합한 것이었다.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은 조선에서 일본의 대동아전쟁을 위한 병력 보충 등 선전·선동 역할을 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국민의용대 조직 및 활동에 일치시키기 위해 해산될 때까지 학병 권유와 내선일체를 외쳤다. 유진오는 총력연맹 문화부에서 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결전소설 공모를 심사했다.
1942년 이후 문단의 중요 행사로 매년 1회씩 3회에 걸쳐 개최된 '대동아문학자 대회'에 대표로 참여했다. 대동아 문예부흥을 목표로 내걸었던 일본의 전시문화 공세의 한 종류로, 여기에 대표로 참가한 사람 중 두 번 연이어 참석한 사람은 이광수, 쓰다, 유진오 세 사람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제는 병력 총동원을 위해 4회에 걸쳐 조치를 실시했다. 1938년 2월 23일 공포, 4월 3일 시행된 육군특별지원병제, 1943년 5월 11일 내각 결정, 10월 1일 훈련소에 입소한 해군특별지원병제, 1943년 10월 1일 공포, 1944년 1월 20일 시행된 학도병 징집, 1944년 4월 1일 징병 검사가 실시된 징병제도였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성려요 성은'이라고 하였다.
조선 내 친일문학계는 이에 부응하여 지원병, 징병 제도 등 병력 동원을 적극 권장하는 노래 가사 만들기 등을 자발적으로 했다. 이광수는 가요 <지원병장행가>를 작사했고, 주요한은 시 <첫 피>로써 지원병의 죽음을 예찬하였다. 유진오는 1943년 11월 한 달 동안 《매일신보》에 12편의 학병 관계 사설을 기고했다. 1943년 11월 18일 유진오의 '병역은 힘이다[14]'는 매일신보 11월 18일자 기사 제1면에 헤드라인으로 게시되었다.
1944년 8월 13일 전국 항복 대강연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강연에서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이 눈앞에 있던 시기에 유진오는 일본의 '영원한 승리'를 다짐하며 '대화일치(大和一致)'를 강조하였다.
1945년 6월 8일 조선언론보국회가 출범하자 유진오는 언론보국회의 평의원에 선출되었다. 그 뒤 조선언론보국회가 주최한 6월 15일 언론총진격 대강연회에 참여한다.
1939년에 조선문인협회가 조직되면서 일본의 태평양 전쟁 법과 과장이 된다. 1943년에는 매일신보에 「병역은 큰 힘이다 (兵役は大きな力だ)한국어」라는 글을 통해 조선인 학도 지원병을 장려했고, 1944년에는 『신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일본어)」를 발표하며 일본 조직 하에서 활동했다.
2. 2. 광복 이후
1945년 광복 직후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를 겸하였으나 사퇴하였다. 해방 이후 언론에 헌법과 관련된 글을 발표함으로써 헌법 문제에 대한 입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1]1945년 8월 16일 임화의 부탁으로 문인 회합에 나갔다가 이태준의 항의로 쫓겨난 뒤, 작가의 길을 접고 교육, 법,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 1946년 변호사 시험위원, 고려대학교 정법대학장이 되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의 헌법 제정 작업 요청을 받았으나, 진주군이 인정한 권력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한민당의 요청은 수락하였다. 1945년 10월 이승만 귀국 후, 신익희가 구성한 '행정연구회'에 참여하여 헌법 제정 작업을 준비하며 미국, 이승만, 한민당 계열 인맥을 활용, 입지를 강화했다.[1]
1946년 미군정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1947년 남조선과도정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헌법 분과위원)을 역임했다.[1]
광복 이후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였고(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초안을 기초했지만, 이승만에 의해 대통령제로 개정됨) 경성대학,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자로 활동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항마로 민중당(1965)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윤보선이 이끄는 신한당과의 단일후보 추대를 이유로 사퇴했다. 1967년 민중당과 신한당이 통합한 신민당 대표위원, 1968년 당 총재가 되었다. 1969년 민주공화당이 추진한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었으나, 1969년 10월 과로로 입원, 1970년 1월 총재직을 사퇴했다. 1974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고문, 1980년 국토통일고문회의 고문, 국정자문위원을 역임했다. 1981년 대한민국학술원 원로회원(헌법)이 되었다.[1]
2. 2. 1. 헌법 제정과 법조, 교육 활동
1945년 광복 직후 잠시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를 겸하였으나 사퇴하였다. 해방 이후 언론에 헌법과 관련된 글을 발표함으로써 헌법 문제에 대한 입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1945년 8월 16일 문학단체 회합에 참여했다가 이태준의 항의로 쫓겨난 뒤, 작가의 길을 접고 교육가, 법학자, 관료, 정치가의 길로 나섰다. 1945년 11월 보성전문학교 교수와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를 겸직하고 학무국 산하 교육심의회의 고등교육분과위원회에서 대학령, 학위령 등 대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법령 초안을 작성했다. 1946년 변호사 시험위원에 위촉되었고, 9월에는 고려대학교 교수 겸 정법대학장이 되었다.
9월 조선인민공화국이 조직되자 헌법 제정 작업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조선인민공화국의 헌법제정 작업은 진주군이 인정한 권력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도외시하고, 친일 지주들로 구성된 한민당의 헌법제정 작업 요청에는 수락하였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하자, 신익희에 의해 구성된 '행정연구회'에 참여하여 헌법제정 작업을 준비하며 미국, 이승만, 한민당 계열로 인맥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1946년 미군정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이 된 뒤, 1947년 6월 남조선과도정부 산하 법전편찬위원회 위원(헌법 분과위원)에 임명되었다. 1946년부터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에 참여하였으며, 국회 헌법기초전문위원, 초대 법제처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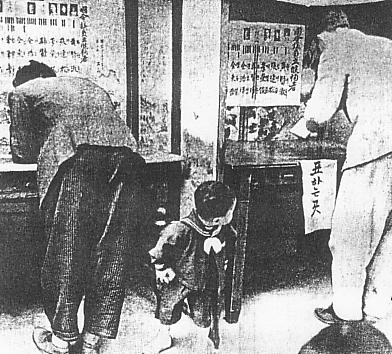
1948년 3월 인촌 김성수의 부탁을 받고 사법부법전편찬위원회에 초안을 작성하여 넘겼다. 김성수는 유진오의 설명을 듣고 토지개혁을 포함한 4대입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법, 중요기업의 국영화를 4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법안은 유진오안과 대동소이하였다.[10]

5월 30일 서울특별자유시 중구의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6월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 서상일, 윤치영, 김준연, 조봉암 등과 함께 헌법 제정에 참여하였다.[16] 6월 1일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에 선임되었고,[17] 헌법기초위원을 겸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초안에는 국민을 '인민'으로 표현했다. 유진오는 국가를 구성하는 자유인으로서의 개인을 표시하는데 국민보다 인민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19]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용어를 문제삼아 유진오를 통박하였다. 그는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유진오)의 사상이 의심스럽다.[19]"고 흥분했다.[19] 유진오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의했고 윤치영은 틀린말 하지 않았다며 맞받아쳤다. 국회에서는 논쟁이 벌어졌고, 윤치영은 인민이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인민이라는 용어는 대한제국의 절대군주 시절에도 사용되던 용어였다.[19] 후에 유진오는 좋은 단어 하나를 공산당에 빼앗겼다며 한탄하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1949년에는 고려대학교 법정대학장이 되었다. 1952년 9월부터 1965년 10월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 고려대학교 임시 관리 책임자,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외교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1951년 대한민국교수단 단장, 전시연합대학 총장(4월 ~ 8월), 고려대학교 총장 서리로 활동했다. 같은 해 한일회담 준비조사차 일본으로 건너갔고, 10월에는 한일회담 대표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1952년 5월에 한일회담 결렬로 귀국했다.
1952년 9월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 대학교에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10월에는 국제 연합 한국대표단 법률고문을 맡았다. 1953년 7월에서 8월까지 유럽 각국을 시찰했고 같은 해에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1954년 대한민국 학술원 종신회원에 위촉되었다.
1955년 연희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20], 같은 해 9월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1959년 재일교포 북송을 반대하여 재일교포 북송반대 전국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재일교포 북송반대 전국위원회 국민대표로 장택상, 최규남 등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일본의 교포 북한송환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뜻을 알리고 귀국하였다.
전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하였고(이때 유진오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초안을 기초했지만, 이승만에 의해 대통령제로 개정됨) 경성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자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起草者)가 되었다.
한국 정부가 시마네현 독도를 포함한 형태로 “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것은 1952년 1월 18일이었다. 이때, 한국 정부에 있던 유진오는 최남선을 찾아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로 주장할 수 있는 도서”의 존재를 질문했다.[3] 유진오는 최남선으로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3]
2. 2. 2. 정치 활동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후 고려대학교 임시 관리 책임자, 중앙선거위원회 위원, 외교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1951년 대한민국교수단 단장, 전시연합대학 총장(4월 ~ 8월), 고려대학교 총장 서리로 활동했다. 같은 해 한일회담 준비조사차 일본으로 건너갔고, 10월에는 한일회담 대표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1952년 5월 한일회담 결렬로 귀국했다.[20]1955년 9월 민주당에 입당하였다. 1959년 재일교포 북송 반대 전국위원회에 참여, 국민대표로 장택상, 최규남 등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교포 북송을 규탄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귀국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국민운동본부장이 되었으며, 1962년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을 받았다. 1964년 8월 13일 아리앙스 프랭세즈 프랑스연합회 한국위원회 명예회원에 위촉되었다. 1965년 10월 고려대학교 총장직 임기 만료로 사임한 뒤 정치에 입문, 1966년 민중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1967년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당한 신민당 대표위원이 된 뒤 6월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68년 신민당 총재로 취임했고, 같은 해 대한국제법학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68년부터 박정희의 3선개헌안 통과 시도가 추진되자 1969년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운명을 걸고 3선개헌 저지운동을 벌이겠으며 경우에 따라 소속의원의 총 사퇴도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21] 1969년 2월 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였다.[21]
1969년 9월 10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1970년 1월 7일 일본 도쿄의 병상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수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22] 1974년 민주회복 국민회의에 참가했다. 이후 병석에 누웠지만 박정희 정권의 회유와 지지 요청을 여러 번 거절하였다.
1971년 종로구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였다.
2. 2. 3. 만년
1979년 10·26 사건 이후 국토통일원 고문과 국정자문위원에 위촉되었으며, 1981년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되었다. 1983년 9월 23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였고, 같은 해 12월 뇌혈전증으로 쓰러져 입원했다. 1983년부터 투병하다 1987년 8월 30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향년 82세로 사망했다.저서로는 《헌법해의》, 《헌법강의》, 《구름 위의 명상》, 《유진오 단편집》 등이 있다.
2. 3. 사후 논란
1987년 8월 30일 사망했을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빈소를 마련해 그의 추모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당시 고려대학교 내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고려대가 친일행위자나 국정자문위원의 빈소가 될 수 없다!"며 철거를 주장해 이른바 ‘현민 빈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그의 사망 당시 고려대 내에 그의 빈소가 차려진 것을 두고 학생과 일부 교수들은 "국정자문위원의 빈소가 고대 내에 차려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반대시위를 벌였다.[23]
동료 교수 5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호소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물러서지 않자 곧 재단측의 출교, 퇴학 조치 압력으로 무산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선정되었다. 2002년 공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도 들어 있으며, 1944년 《신시대》에 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등 총 8편의 친일 작품명이 공개되었다.[24] 2005년 고려대학교 교내 단체인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발표한 '고려대 100년 속의 일제잔재 1차 인물' 10인 명단에 포함되었으며[2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2008년 8월, 학술지 ‘한국사 시민강좌’ 하반기호(43호)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특집 -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을 선발, 건국의 기초를 다진 32명을 선정할 때 법률, 경제 부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26]
3. 주요 저서 및 작품
유진오는 소설과 번역 작품을 통해 문학 활동을 펼쳤으며, 그의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도 소개되었다. 대표적인 소설로는 창랑정기와 김강사와 T교수가 있다.
3. 1. 저서
- 《헌법기초회고록》 (1981)
- 《민주정치에의 길》 (1963)
- 《양호기》 (養虎記) (1977)
- 《미래를 향한 창》 (1978)
- 《구름 위의 만상》
3. 2. 논문
| 제목 | 발간 연도 |
|---|---|
| 《헌법해의》(憲法解義) | 1949년 |
| 《헌정의 기초이론》 | 1950년 |
| 《헌법강의》 | 1953년 |
3. 3. 소설
| 작품명 | 번역자 | 출판 정보 |
|---|---|---|
| 창랑정기 | 신건 | 『조선소설대표작집』 (교재사, 1940년) |
| 여름 | 역자 미상 | 『문예』 8권 7호 (1940년) |
| 창랑정기 | 청산 슈오 | 『조선단편소설선집』 (대학서림, 1981년) |
| 창랑정기 | 오무라 마스오 | 『조선단편소설선』 (이와나미 서점, 1984년) |
| 김강사와 T교수 | 오무라 마스오 | 『조선단편소설선』 (이와나미 서점, 1984년) |
| 김강사와 T교수 | 안 우식 | 『슈에이샤 갤러리 세계의 문학 20 중국·아시아·아프리카』 (슈에이샤, 1991년) |
4. 가족 관계
| 관계 | 이름 | 출생 | 사망 | 비고 |
|---|---|---|---|---|
| 아버지 | 유치형 | |||
| 아내 | 박복례(朴福禮) | |||
| 장인 | 이명래 | 1890년 6월 20일 | 1952년 1월 6일 | 이명래고약 창업주[28] |
| 아내 | 이용재(李容載) | 1921년 | 2009년 11월 12일 | 이명래고약 대표, 의사, 이명래의 딸[28] |
| 딸 | 유효숙(兪孝淑) | 1930년 3월 27일 | ||
| 사위 | 한만년 | 2004년 이전 | 일조각 대표 | |
| 외손 | 한홍구 | 대학 교수, 역사학자[7] | ||
| 딸 | 유충숙(兪忠淑) | 1933년 9월 25일 | ||
| 사위 | 박동진 | 1922년 10월 11일 | 전 외무부장관, 국회의원[6] | |
| 아들 | 유완 | 교육인, 전 연세대학교 교수 | ||
| 아들 | 유종 | 음악가, 포항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 ||
| 딸 | 유경숙 | 1939년 | ||
| 손자 | 유동 | 1970년 | 법조인[27] |
5. 평가 및 비판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선정되었다. 2002년 공개된 친일 문학인 42인 명단에도 포함되었으며, 1944년 《신시대》에 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등 총 8편의 친일 작품명이 공개되었다.[24] 2005년 고려대학교 교내 단체인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발표한 '고려대 100년 속의 일제잔재 1차 인물' 10인 명단에 포함되었고,[25]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논의가 한창이던 1948년 8월 27일 초기 국회의사당에서 김인식 의원이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유진오에게 친일 혐의를 지적하자, 이신태·차랑보 등 방청객 2명이 "반민법은 시기상조다. 너희들도 친일파가 아니냐", "국회에서 친일파를 엄단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빨갱이다"라는 내용의 삐라를 뿌린 사건이 있었다.[29]
유진오의 친일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13·17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0: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68∼816)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30] 사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4]
6. 역대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 종류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1967년 |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신민당 | 55,703표 (69.68%) | 1위 | 당선 | 초선 |
참조
[1]
웹사이트
유진오(兪鎭午)
https://encykorea.ak[...]
2023-08-17
[2]
기타
[3]
웹사이트
竹島問題、日本政府はなぜ対処できなかったのか
http://ironna.jp/art[...]
[4]
웹사이트
06년 12월6일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 명단 확정 공개
https://m.hankookilb[...]
2021-12-06
[5]
웹사이트
[세상읽기] 조선일보와 한홍구 교수의 싸움
https://m.khan.co.kr[...]
2015-10-19
[6]
웹사이트
[원희복의 인물탐구] 한홍구 “독재헌법에도 빨갱이 마구 죽일 조항 없었다”
https://m.khan.co.kr[...]
2018-07-22
[7]
웹사이트
'박정희 죽어야' 한홍구는 '금수저 좌파'?
https://www.chosun.c[...]
2015-10-14
[8]
서적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9]
서적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10]
서적
인촌김성수전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1976
[11]
간행물
친일문학선집 2
1940-07
[12]
간행물
일사불란의 그 훈련
1940-12
[13]
간행물
동양과 서양
1943-01-09
[14]
간행물
1943-11-18
[15]
간행물
친일문학선집 2
1944-09
[16]
뉴스
인터뷰 제헌절 32돌…제헌헌법 기초 유진오 박사에게 듣는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80-07-16
[17]
웹사이트
헌법기초위원회 - 네이트 백과사전
http://100.nate.com/[...]
[18]
서적
안녕 헌법
지안출판사
2009
[19]
서적
안녕 헌법
지안출판사
2009
[20]
웹사이트
유진오:네이트 한국학
http://koreandb.nate[...]
[21]
서적
대의는 권력을 이긴다
에디터
2002
[22]
서적
한국현대사산책
인물과사상사
2004
[23]
뉴스
고려대 총학, 김성수 등 친일파 10명 명단 발표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03-28
[24]
저널
친일문학 작품목록
http://www.artnstudy[...]
2002-08
[25]
뉴스
고대 총학 ‘친일행적’ 10명 발표
http://www.hani.co.k[...]
한겨레
2005-03-28
[26]
뉴스
혼돈의 해방공간서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다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8-08-22
[27]
뉴스
故 유진오박사 손자 유동씨 美 국제로펌 변호사로 활약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28]
뉴스
[명복을 빕니다]故유진오 박사 부인 이용재 여사
http://news.donga.co[...]
donga.com
[29]
뉴스
‘국부’ 이승만의 궤변 “현직에 있는 친일파 처단하면 혼란”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30]
웹사이트
유진오(兪鎭午)
http://encykorea.aks[...]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검토 중…"윤석열 견제 안 해"
문형배,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블로그 글..."대통령-국회 갈등 해결방도 없다" | JTBC 뉴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