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성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의 여성은 역사적으로 사회, 교육, 법률, 직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가부장적 규범 속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했으나,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의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지위가 향상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성들이 독립 운동에 참여하며 역할 변화를 겪었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헌법적 권리를 획득하며 교육,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 유리 천장,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저해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여성 운동은 1890년대 찬양회 창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최근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군대 내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여성 대상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여성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 작품 상영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여성영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며, 아시아 여성 영화 인력 발굴 및 사회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영화제이다. - 대한민국의 여성 -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성폭력 특별법 제정, 호주제 폐지 등을 거치며 발전해 왔고, 1990년대부터 페미니즘 리부트, 디지털 성범죄,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등 다양한 쟁점을 통해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평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 역사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공식적인 교육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가정 내에서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받았다.[92][12]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집에서 시댁 식구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주된 의무로 여겨졌다.[92][12]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남아선호사상이 강했으며, 이는 성 감별이나 성 선택적 낙태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94][14][95][15] 여성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이나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고,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96][17]
19세기 말부터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면서 여성 교육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다.[96][17] 교육받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계몽하고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1890년대 찬양회를 시작으로 여성 교육과 성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여성 운동이 시작되었다.[17][18]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에는 많은 여성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 변화의 계기를 맞기도 했지만,[98][20] 동시에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비극을 겪었다.[97][19]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여성은 헌법상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99][21] 여성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사회 각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특히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100][22] 1973년에는 차별적인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단체연합이 결성되어 1991년 주요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18] 2013년에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당선되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공약했던 정책들이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101][23]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100][22]
2. 1. 전통 사회
전통적인 한국 사회, 특히 조선 시대에 여성의 지위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 아래 매우 제한적이었다. 여성들은 공식적인 고등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92][12]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주부이자 현모양처로서 가정 내의 일에 국한되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다.[92][12]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집에서 시부모를 포함한 남편의 모든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살아야 했다.[92][12] 또한 사회적으로 남성처럼 발언권을 갖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으며, 대신 남편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강조되었다.[96][17]당시 사회는 여성에게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을 강하게 기대했다.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여, 여성이 딸을 낳았을 경우 비난을 받기도 했다.[94][14] 이러한 남아선호 이데올로기는 태아의 성 감별이나 성 선택적 낙태와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95][15] 아들을 낳는 능력은 여성의 가정 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16]
여성의 지위는 19세기 말에 이르러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면서 여성 교육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96][17] 이들 학교 중 일부는 문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전까지 교육 기회가 거의 없었던 대다수의 여성들에게 이는 중요한 변화였다. 교육받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계몽하는 활동에도 참여했으며, 이는 이후 여성들이 사회·정치 운동에 참여하는 기반이 되었다.[96][17] 한국 여성 운동은 1890년대 찬양회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성 교육 증진, 성 차별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여러 단체가 결성되었다.[18]
2. 2. 근대화와 여성 운동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공식적인 고등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주로 가정 내 역할에 한정되어 순종적인 태도를 배우도록 교육받았다.[92][12] 여성의 역할은 주부이자 좋은 어머니로서 가정을 돌보는 데 한정되었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로 여겨졌다.[92][12]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집에서 시부모를 포함한 남편 가족 전체를 돌봐야 했다.[12]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딸을 낳을 경우 비난받기도 했다. 이러한 남아 선호 사상은 성별 선택[94]과 성 선택적 낙태로 이어지기도 했다.[95][15]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성은 무시당했으며,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16] 여성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이나 참여 기회가 거의 없었고, 남편을 보조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기대되었다.[96][17]여성의 지위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많은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근대 학교를 설립했는데, 이 중 일부는 여성을 위한 학교였다.[96][17] 이 학교들은 문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여성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이는 중요한 변화였다.[96][17]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 문제에 눈뜨게 되었고, 다른 여성들을 계몽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며 정치 운동의 기반을 마련했다.[96][17] 한국 여성 운동은 1890년대 찬양회 창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여성 교육 확대, 성 차별 철폐 등을 목표로 하는 여러 단체가 결성되었다.[18]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동안 한국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98][20] 일제는 여성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켰으나, 많은 여성은 여성애국동지회, 대한애국부인회와 같은 지하 저항 단체에 참여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18] 이 시기에는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비극도 있었다.[97][19]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교육받고 정치 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점차 변화했다.[20]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수립되면서, 여성은 교육, 노동, 공적 생활 참여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얻었다.[99][21] 여성 교육을 위한 여러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예술,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다.[99][21] 전문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100][22]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여성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으며, 이는 더 많은 전문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했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100][22]
2. 3.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전 시대와 달리 일부 여성들은 교육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17][98] 1890년대 찬양회와 같은 여성 단체들이 교육 기회 확대와 성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했으나,[18]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일제는 이러한 여성 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많은 여성들은 여성애국동지회, 대한애국부인회와 같은 지하 저항 단체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다.[18]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독립운동 참여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0]그러나 일제강점기는 한국 여성들에게 큰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다.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되어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끔찍한 인권 유린을 겪어야 했다.[19][97] 이는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
2. 4.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수립되었고 여성은 교육, 일, 공적 생활을 추구할 헌법상의 동등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99][21] 여성 교육을 위한 여러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이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예술, 교육, 경제 활동 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여성들과 성 평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99][21]전문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특히 GDP 증가 측면에서 사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100][22]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이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로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 의학, 공학, 학문, 예술, 법, 문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100][22]
한편, 1973년 한국 여성 단체들은 차별적인 1957년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했다. 이 문제는 20세기 후반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이 되었고, 1991년 가족법의 주요 개정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18]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가 당선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문화 참여가 계속 확대되고 다양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 혁명'을 추진하고 육아 지원, 승진 기회 확대, 급여 평등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대표 확대, 여성 고용 촉진, 여성 근로자 지원, 여성 교육 기회 확대,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등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정책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다.[101][23]
3. 법적 권리
대한민국 헌법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법적 지위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여성은 투표권, 운전면허 취득권, 재산 소유 및 상속권 등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획득했다.[84][5]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5]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기존 법률의 차별적 요소를 개정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며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103] 이러한 노력은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시도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이루어졌다.[102][24]
주요 입법 성과로는 2013년 결혼강간 처벌 규정 마련[105][26],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2015년)[106][27], 2021년 낙태죄 처벌 조항 효력 상실을 통한 사실상의 비범죄화[107][31] 등이 있다.
이러한 법적 권리의 신장과 성 평등 관련 법률의 시행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84][5] 하지만 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104][25], 여성 복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108][28] 등 법적 권리가 현실에서 완전히 구현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1.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권리의 평등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문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성차별이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참여에 장애가 되며, 발전과 평화, 인간 복지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사회와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사국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102][24]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1948년부터 여성은 투표권, 운전면허 취득권, 재산 소유 및 상속권을 법적으로 획득했다.[84][5] 또한,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5]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기존 법률의 차별적 요소를 개정하며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기간에 다양한 성 평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103]
성 불평등과 편견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증가했다.[84][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은 한국 사회 구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04][25]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2013년에 결혼강간을 범죄로 규정하여 불법화했다.[105][26] 또한, 1995년에 제정되어 여성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은 한국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기도 했으나, '성별', '여성', '양성평등' 등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학계 간의 이견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 여성 정책의 성별 이해 방식과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교차성 개념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을 더욱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06][27]
2021년에는 여성의 낙태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107]
한편, 여성 복지 정책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여성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부양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로 한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정책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108][28]
3. 2. 성 평등 기본법
1995년에 제정되어 한국 여성 정책의 법적 근거로 사용되어 온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27]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개정을 한국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보는 다양한 담론이 생산되었다.[27]그러나 이 개정 과정에서 "성", "여성", "성 평등" 및 "성인지 관점"과 같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흔들렸고, 용어를 둘러싼 정치계와 학계 사이의 간극이 나타나기도 했다.[27]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여성 정책이 성별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차성의 개념을 통해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27]
한편, 한국 여성 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 인식 조사 결과, 여성 복지 정책 분야에서 성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 복지 공무원들은 여성의 성 역할을 전통적인 '부양 대상자'나 '돌봄 제공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정책 집행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28] 따라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28]
3. 3. 낙태 비범죄화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의 낙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31][107]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더 존중하고, 필요한 낙태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법적 장벽을 제거한 조치이다.[31][107]기존 형법(1953년 제정)은 낙태를 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었다.[31]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32]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이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33] 정부는 2020년 10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 시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33] 결과적으로 법 개정 시한이 지나면서 해당 처벌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31]
4. 교육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정규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으나, 19세기 말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1886년 설립된 학교는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했으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여학교가 세워졌다.[109][34]
여성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 수도 증가하여, 1987년에는 여성의 고등 교육 등록률이 28%에 달했다.[34]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점차 독립적인 직업 활동과 사회 참여를 추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헌법은 여성의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문해율은 2002년 기준 96.6%로 크게 향상되었고,[110][35] 2008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취학률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111][36] 이러한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지위 향상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22]
4. 1. 근대 교육의 시작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고, 문해율 또한 낮았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여성을 위한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886년, 감리교 선교사들은 초등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는 1945년 대학으로 승격하여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여자대학교인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했다.[109][34]
이화학당 설립 이후 여러 여자 학교들이 뒤이어 세워졌다. 1890년대에는 수도인 서울에 정신여학교(현 정신여자고등학교)와 배화여학교(현 배화여자고등학교) 등이 설립되었다. 여성 교육기관은 점차 확대되어 1987년에는 전문대학, 단과대학, 대학교를 포함하여 약 10개의 여성 고등 교육 기관이 존재했다. 당시 고등 교육 여성 등록률은 28%였으며, 약 262,500명의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1987년 기준으로 대학 및 대학 교육자 중 여성의 비율은 16%에 머물렀다.[34]
현대 한국 사회에서 헌법은 여성의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교육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 기회 확대로 인해 여성의 문해율은 크게 향상되었다. 1970년 87.6%였던 문해율은 2002년 추정치에서 97.9%(여성 96.6%, 남성 99.2%)까지 증가했다.[35] 또한 2008년 추정치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률은 약 99%, 고등학교 취학률은 약 96.6%에 달해, 대부분의 여성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36]
4. 2. 고등 교육 확대
과거 한국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이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웠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즉 문해율이 낮았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여성을 위한 현대식 학교를 설립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886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초등학교는 1945년 대학교로 승격되어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손꼽히는 여자 대학이다.[109][34]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정신여자고등학교, 배화여자고등학교 등 많은 여성 학교가 세워졌다. 1987년까지 한국에는 전문대학, 단과대학, 대학교를 포함하여 약 10개의 여성 고등 교육 기관이 있었다. 당시 여성의 고등 교육 등록률은 28%였으며, 약 262,500명의 여학생이 고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과거에 비해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는 증가했지만, 같은 해 대학 내 여성 교원의 비율은 16%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34]
대학 교육을 받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많은 고학력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독립적인 직업 활동을 추구했으며, 결혼 상대를 직접 선택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 대학생 시위에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헌법은 여성의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교육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여성의 문해율은 1970년 87.6%에서 2002년 96.6%로 크게 향상되었다 (같은 해 전체 문해율 97.9%, 남성 99.2%).[110][35] 2008년 추정치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률은 약 99%, 고등학교 취학률은 약 96.6%에 달한다.[111][36] 이는 현대 한국 여성 대부분이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4. 3. 문해율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그 결과 문해율이 낮았다.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여성들을 위한 현대식 학교를 설립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1886년 감리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초등학교는 이후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이 대학은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여자대학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34][109] 이후 정신여자고등학교, 배화여자고등학교 등 여러 여성 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헌법은 여성의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교육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의 문해율은 크게 향상되었다. 1970년 전체 문해율은 87.6%였으나, 2002년 추정치에 따르면 97.9%까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여성의 96.6%, 남성의 99.2%가 문해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110][35]
교육 기회의 확대는 취학률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추정치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률은 약 99%에 달하며, 고등학교 취학률 역시 약 96.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111][36] 이는 현대 한국 여성 대부분이 기본적인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5. 가정 생활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주로 가정 내 역할에 국한되었다. 여성은 순종적인 태도를 배우고 현모양처로서 남편과 시댁 식구를 돌보는 것이 주된 의무로 여겨졌으며,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웠다.[12]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남아선호사상[14]은 여성의 가정 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무시당하는 대우를 받기도 했으며, 이는 성 감별과 성 감별 낙태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15][16] 여성은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남편을 보조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17]
이러한 가부장제적 가족 규범은 산업화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러 형태로 지속되며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세 내용은 하위 섹션 가족주의와 성 불평등 참고)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시대 변화와 함께 법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는 가족법 개정[18], 호주제 폐지 논쟁[37], 2015년 간통죄 폐지[38] 등과 같은 사회적 논의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 (상세 내용은 하위 섹션 여성의 역할 변화 참고)
5. 1. 가족주의와 성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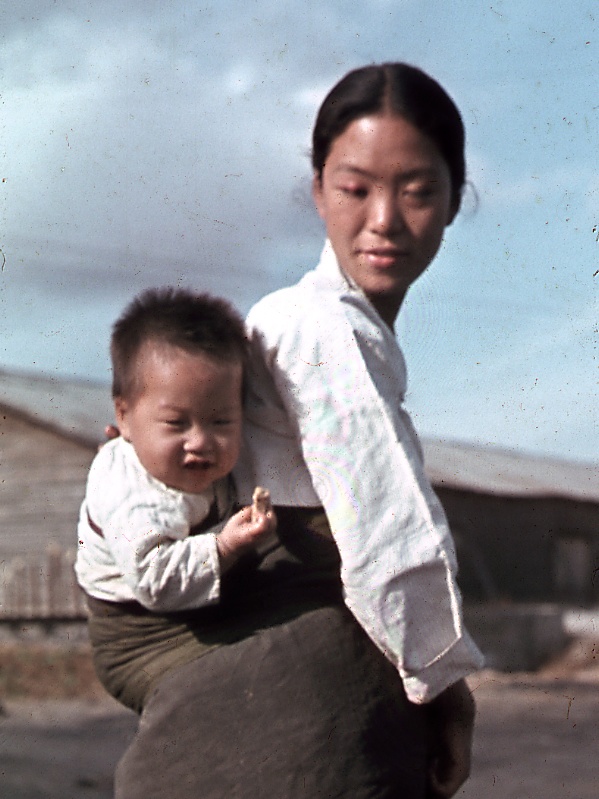
산업화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가부장제적 가족 규범의 영향으로 성 평등한 가족 문화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특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강조된 가족주의는 개인의 권리보다 가족 전체의 안정을 우선시하며, 가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여성을 가족 구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여성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 역사 속에서 여성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성 불평등이 가족 생활 문화를 통해 강화되고 재생산되어 온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을 가부장적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통적인 결혼과 친족 관계는 여성을 제사, 상속, 재산 소유 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37]
한편,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간통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38]
5. 2. 새로운 가족 형태
대한민국에서 결혼과 전통적인 가족 구조는 주로 이성애 관계로 이루어진 제도로 여겨져 왔다. 이는 남성이 가장 역할을, 여성이 주부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반하며, 가족 내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가계의 자본 축적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구조는 오랫동안 지속된 가부장제적 가족 규범의 영향을 보여주며, 산업화 과정에서 강조된 가족주의는 개인보다 가족 전체를 우선시하며 이러한 가부장적 모습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가족 구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겨져 고유한 권리를 침해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결혼과 친족 관계는 여성을 제사, 상속, 재산 소유 등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37]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 구조, 특히 이성애 중심의 결혼과 주택 및 대출 구조에 내재된 문제점들은 한국 여성들이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39] 연구자 Jesook Song은 이러한 현상을 여성이 전통적인 가족 패턴에서 벗어나 공간적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40] 특히, "''부모와 별거하여 혼자 사는 여성은 한국에서 특이하게 여겨지는데, 유교적 가부장적 사상은 여성을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39]라는 지적처럼, 여성의 독립적인 삶은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기도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했으며, 1인 및 2인 가구를 합하면 전체 가구의 58.1%에 달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41] 이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던 과거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젊은 세대는 20대에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학업과 직장 생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와 달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이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독립적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의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42] 이러한 변화는 호주제 폐지 논쟁[37]이나 2015년 2월 간통죄 폐지[38] 등 가족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5. 3. 여성의 역할 변화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 내에 머물며 현모양처로서 남편과 가족을 돌보는 것에 한정되었다.[12] 여성은 정규 교육 기회가 적었고, 순종적인 태도를 강요받았다. 특히 남아선호사상[14]은 여성의 지위는 아들 출산 여부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이는 성 감별과 성 감별 낙태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15][16] 여성은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남편을 보조하는 존재로 여겨졌다.[17]여성 역할 변화의 움직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여성들을 위한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17] 교육 기회를 얻은 여성들은 점차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1890년대 찬양회 결성을 시작으로 여성 교육 확대와 성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여러 여성 단체가 조직되었다.[18]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한국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비극을 겪었지만[19], 동시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나갔다. 여성애국동지회, 대한애국부인회와 같은 지하 조직에서 활동하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18][20]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여성은 헌법에 따라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21] 여성 교육 기관이 늘어나면서 고등 교육을 받는 여성이 증가했고,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이어졌다. 여성들은 교육,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키웠고, 이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22]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전통적인 성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적, 제도적 변화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1973년 여러 여성 단체가 연합하여 차별적인 가족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오랜 노력 끝에 1991년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다.[18] 이후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으며[37], 2015년에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38]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는 보육 지원 확대, 여성 고용 차별 해소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23]
산업화와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가족주의 문화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이성애 중심의 결혼관과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39], 이는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40] 하지만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고(2019년 기준 30.2%[41]), 결혼이나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서[42]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 여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이 여전히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만[44],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5. 4. '매니저 맘'의 등장
'매니저 맘'은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어머니상을 가리킨다.[44] 특히 신자유주의적 사회 변화는 가족 내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교육 지원자로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배경이 되었다.[44]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다양한 별명으로 불리는데, '매니저 맘'은 그중 널리 알려진 이름 중 하나이다.[44] 이들은 자녀의 학교 숙제, 학점 관리,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교육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매니저 맘'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교육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여 자녀를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되기도 한다.[43]
이러한 관리 과정은 자녀가 매우 어릴 때, 심지어 보육원에 다닐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은 이후 화이트칼라 직업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따라서 '매니저 맘'의 활동은 자녀의 미래 성공을 목표로 하며, 이는 곧 가족 전체의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자녀의 성공은 가족이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의 사회적 이동성이 어머니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43]
현대 한국 사회는 개인이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고 관리해야 하는 분위기를 강조한다. '매니저 맘'은 자신의 무급 가사 노동과 관리 능력을 통해 이러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노력은 흔히 자연스러운 모성애의 발현으로 여겨지며, 어머니는 자녀의 성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녀의 성과로 어머니의 노력이 평가받는 반면, 정작 어머니 자신의 노력과 성공은 충분한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3]
'매니저 맘' 현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복합적이다. 한편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보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한다. '매니저 맘'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원은 종종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전업주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직장 여성이나 노동자 계급의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감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결국 '매니저 맘'의 등장은 현대 한국 사회와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43][44]
6. 직업 생활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가정 내 역할에 머물렀으며,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다.[12]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들을 낳는 능력에 크게 좌우되었고, 남아선호사상[14]은 성 감별과 낙태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15][16]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17]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현대식 여성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교육받은 여성들은 여성 계몽 운동과 정치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890년대 찬양회를 시작으로 여성 교육과 성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여러 단체가 결성되었다.[17][18]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아픔을 겪었으나[19], 동시에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이끌었다.[18][20]
해방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여성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았고,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었다.[21] 여성들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며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22] 또한, 1973년 여성단체연합 결성을 통해 차별적인 가족법 개정 운동을 벌이는 등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18]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22]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그가 약속했던 보육 지원 강화, 승진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이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23]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와 고위직 진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유리 천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45][47] 또한 많은 여성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48][50],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 저임금, 복지 혜택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55][56][57]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이중 노동 시장 구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6. 1. 노동 시장 참여 증가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2014년 한국 여성의 노동 인구는 57%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1995년의 47.6%에서 상승한 수치이다.[46] 그러나 이러한 여성 고용 통계의 증가는 임금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2013년 보고된 성별 임금 격차는 36.3%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47]또한 2013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 천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고위직 여성의 부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45]
한국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WFC) 척도를 사용하여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이 증가할수록 여성의 직장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이는 여성이 직장에서 "임시로" 머문다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이 가계 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49], 여전히 간병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고위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가족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50] 특히 한국의 대졸 여성은 비학위 소지자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51]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예를 들어, 보육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절반 이상의 기업이 사내 보육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간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 제공, 전일제 미만 근무 허용, 출산 휴가 후 복귀하는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50]
하지만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실제로 이용하는 여성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50] 이러한 상황에는 한국의 낮은 출산율(가족당 1.19명)[52]도 영향을 미친다. 적은 수의 자녀에게 교육과 보육의 질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53]
여성 근로자가 직장에서 경험하는 성차별 인식에는 "상사 및 리더에 대한 인식"과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4]
한국의 성별 시스템은 노동 시장 및 복지 국가와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은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국가 및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유급 노동, 무급 노동(특히 간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55][56][57] 이러한 상황은 사회 보험 중심의 복지 국가, 이중 노동 시장 시스템, 남성 부양자 중심의 성별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이중 노동 시장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5][56][57]
한편, 여성의 유리 천장을 극복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은 2012년 여성 3명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으며[58], 임원직의 최소 1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2013년에는 권선주가 국책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CEO로 임명되어 한국 최초의 여성 은행장이 되었다.[59]
6. 2. 성별 임금 격차
2013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 천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고위직 여성 부족 문제로 인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45] 이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47.6%였던 여성 노동 인구 비율은 2014년 57%까지 상승했다.[46]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가 임금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6.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47]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WFC)이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48] 이는 여성이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직장을 "임시로" 머무는 곳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도 여전히 존재한다.[48]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계 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점차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 부양의 주된 책임은 남성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49] 동시에 여성은 간병 책임까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고위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가족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50] 특히 대졸 여성은 비학위 소지자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51]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의 보육 시설 설치 지원, 육아 휴직 제도 운영, 유연 근무 허용, 출산 휴가 후 복귀 여성 재고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50]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낮은 출산율(가족당 1.19명, 2013년 기준)[52] 속에서 한두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53]
직장 내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사 및 리더에 대한 인식"과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이는 리더십과 조직 문화가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성별 시스템은 노동 시장 및 복지 국가와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사회 보험 및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등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55][56][57] 이는 여성을 주로 간병인이나 부차적 소득자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는 '층위별 남성 생계 지원' 모델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다.[55]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약한 사회적 권리는 사회 보험 중심의 복지 국가, 이중 노동 시장 시스템, 남성 의존형 성별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중에서도 이중 노동 시장 시스템의 문제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중 노동 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5]
한편, 여성의 유리 천장을 깨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삼성은 이례적으로 3명의 여성을 임원으로 승진시켰으며,[58] 임원직의 최소 1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2013년에는 권선주가 국책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은행장이 되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은행 CEO가 탄생했다.[59]
6. 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2013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친화력을 나타내는 5가지 지표로 구성된 유리 천장 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고위직 여성 부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45]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47.6%에서 2014년 57%로 늘어났다.[46] 그러나 이러한 참여 증가가 임금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3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36.3%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47]
한국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WFC) 척도를 사용하여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일과 가정 양 영역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했다.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이 높을수록 직장 만족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이는 여성 근로자의 직장이 '임시적인' 곳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가계 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점차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여전히 주된 부양의 책임은 남성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49] 동시에 여성은 간병 및 육아의 주된 책임자로 여겨지며, 실제로 경력 단절을 경험하거나 고위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가족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50] 특히 대졸 여성은 비학위 소지자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51]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 시설 건설 기업 지원, 육아 휴직 확대(연간 30일 이상), 유연 근무(전일제 미만 근무) 허용, 출산 휴가 후 복귀 여성 재고용 기업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50]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여성은 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낮은 출산율(가족당 1.19명)[52]로 인해 한두 자녀에게 교육과 보육의 질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일-가정 양립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53]
직장 내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사 및 리더에 대한 인식"과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4]
한국의 성별 분업 구조는 노동 시장 및 복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은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국가 및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유급 노동, 무급 가사 노동, 간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이는 여성을 주된 간병인이자 부차적 소득자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성별 시스템의 영향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중산층 기혼 여성에게 더 강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의 성별 시스템은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용하는 '층위별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사회적 권리는 사회 보험 중심의 복지 국가, 이중 노동 시장 시스템, 남성 의존형 성별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중 노동 시장 구조의 개선 없이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55][56][57]
6. 4. 유리천장
2013년,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 천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여성 근로자 친화력을 나타내는 5가지 지표 중 특히 고위직 여성 부족 문제로 인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45]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47.6%였던 여성 노동 인구 비율은 2014년 57%까지 상승했다.[46]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가 임금 평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6.3%로,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47]
한국 기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WFC) 척도를 활용하여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일-가정 갈등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직장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48] 이는 여성 근로자의 직장을 "임시적인" 곳으로 여기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이 가계 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점차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 부양의 주된 책임은 남성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49] 또한 여성은 간병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며, 경력을 중단하거나 고위직에서 물러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가족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50] 특히 한국의 대졸 여성은 비학위 소지 여성보다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51]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의 보육 시설 설치 지원, 육아 휴직 확대, 유연 근무 허용, 출산 휴가 후 복귀 여성 재고용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50]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는 여성은 여전히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여기에는 가족당 자녀 수가 1.19명[52]에 불과한 낮은 출산율 속에서 소수 자녀의 교육과 보육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53]
직장 내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상사 및 리더에 대한 인식"과 "그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한국의 성별 시스템은 노동 시장 및 복지 국가와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은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국가 및 기업 복지에서의 배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55][56][57] 이로 인해 여성은 근로자, 부모, 배우자, 시민으로서 가지는 유급 노동, 무급 노동, 간병 등에 대한 권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이는 여성을 전통적인 간병인 및 부차적 소득자로 규정하는 성별 시스템의 영향으로,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기혼 여성에게 기대되는 "남성 생계 보조" 역할은 주로 중산층 여성에게 해당하며, 이는 한국의 성별 시스템이 전형적인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보다는 "층위별"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사회적 권리는 사회 보험 중심의 복지 국가, 이중 노동 시장 시스템, 남성 의존형 성별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이중 노동 시장 문제 해결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55][56][57]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의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삼성은 이례적으로 3명의 여성을 임원으로 승진시켰으며, 향후 임원직의 최소 1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58] 2013년에는 권선주가 국책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은행장으로 취임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 은행 CEO가 되었다.[59] 또한 2021년에는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한국 여성의 역량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60][61]
7. 여성 운동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은 19세기 말 찬양회 결성을 시작으로[18] 여성 교육 확대와 성차별 철폐를 목표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저항했고,[18][20] 광복 이후에는 분단 상황 속에서도 가족법 개정 운동[18] 등을 통해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여성들은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교육받은 여성들은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며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21]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교육 수준 또한 높아졌고, 이는 다시 전문 분야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특히 GDP 증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22]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당선되면서 여성의 사회·경제·문화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 지원 강화, 여성의 승진 기회 확대, 급여 평등 등을 포함한 '여성 혁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임기 중 이러한 약속들이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23]
7. 1. 초기 여성 운동
19세기 말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주로 가정 내 역할에 국한되었다.[12] 순종적인 태도가 강조되었으며, 현모양처로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의무로 여겨졌다.[12]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 여성의 지위는 아들을 낳는 능력에 크게 좌우되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다.[14][15][16] 사회적으로 여성은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남편을 보조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17]여성의 지위 개선 움직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현대식 학교를 설립하면서 여성 교육의 문이 열렸다.[17] 이들 학교 중 일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문학, 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여성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였다.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는 여성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교육받은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을 가르치며 여성들의 정치 및 사회 참여를 이끌었다.[17]
본격적인 한국 여성 운동은 1890년대 찬양회의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찬양회를 필두로 여성 교육 확대, 성차별 철폐, 그리고 사회 내 여러 차별적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여성 단체들이 연이어 결성되었다.[18]
그러나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다시 어려워졌다. 일제는 공개적인 여성 단체 활동을 금지했다.[18] 이에 많은 여성들은 탄압을 피해 여성애국동지회(女性愛國同志會),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와 같은 지하 조직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18] 이 시기 많은 한국 여성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19] 일제강점기 동안의 이러한 경험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20]
7. 2. 일제강점기 여성 운동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의 변화를 이끌었다. 19세기 말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을 통해 여성 교육의 기회가 열렸고, 이를 바탕으로 찬양회와 같은 초기 여성 단체들이 조직되어 여성 교육과 성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17][18]그러나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러한 여성 단체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굴하지 않고 여성애국동지회, 대한애국부인회와 같은 지하 저항 단체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이어갔다.[18] 여성들은 일제의 억압에 맞서 싸우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한편, 이 시기 수많은 한국 여성들(최대 20만 명으로 추산)이 일본 군대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19]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여성들의 독립운동 참여와 사회 활동은 계속되었으며, 이는 광복 이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20]
7. 3. 분단 이후 여성 운동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한국의 여성 운동 역시 남북으로 나뉘어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모든 여성 운동이 조선민주여성동맹이라는 단일 조직 아래로 통합되었다. 반면, 남한에서는 다양한 여성 단체들이 활동하다가 1959년 대한여성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 여성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18]남한의 여성 운동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1957년에 제정된 차별적인 가족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1973년, 여러 여성 단체들은 가족법 개정을 위한 범여성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개정 운동에 나섰다. 이 운동은 20세기 후반 한국 여성 운동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오랜 노력 끝에 1991년에 이르러 가족법의 주요 내용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18]
7. 4. 미투 운동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페미니즘 개념 속에서도 미투 운동이 뿌리를 내렸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면서 일부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2018년 1월 말까지는 언론 보도가 부족하여 크게 확산되지 못했으나, 이후 수십 명의 유력 공인들이 연루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강한 가부장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이루어 왔기에, 미투 운동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대통령 내각 구성원의 30%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져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통해 직장 내 성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미투 운동은 이미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했던 대한민국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오프라인 시위를 조직하고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29]
8. 군대 내 여성
대한민국 징병제는 1957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남성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여성은 1950년 한국 전쟁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 되었으며, 현재 군 복무 의무는 없지만 자원하여 입대할 수 있다.[62]
초기 여군은 주로 선전, 통신 등 후방 지원 업무에 국한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군대 내 여성의 역할과 참여 기회가 점차 확대되었다. 1990년부터는 여성에게 부여되는 업무 범위가 넓어졌고, 현재 여성 군 입대자들은 남성들과 동일한 기본 훈련을 받는다. 군 내 여성의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약 2,100명(전체 군인의 1% 미만)에서 2020년에는 약 7,550명(전체 군인의 약 8.8%)으로 늘어났다.[63][64]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 군인들은 여전히 진급 및 보직 임명 등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최초의 여성 장성(준장)은 2002년에 배출되었다.[63]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8. 1. 여성 군인의 역사

대한민국 징병제는 195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남성 시민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여성은 1950년부터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현재 여성은 군 복무 의무는 없지만, 자원하여 군에 입대할 수 있다.[62]
대한민국 육군에서 복무한 최초의 여성들은 한국 전쟁 발발에 대응하여 1950년에 입대한 자원군이었다. 약 5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이 자원군은 모든 남성 전투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지만, 주로 선전 및 통신과 관련된 후방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 자원군은 1951년에 해산되었고, 소속 여성들은 제대했다.
1955년에는 여성 군인 양성을 위한 여군 훈련소가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통신, 속기, 타자 업무를 수행할 여성을 모집했다. 당시 대한민국 군대 내 여성의 수는 제한적이었고, 입대한 여성에게는 남성과 동등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여군이 전투에서 남성만큼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여성 장교들이 기초 훈련의 신체적 강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980년대 군사 정권에서 민간 정부로 이양되면서 성 평등 문제가 국가 정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 시기 여성 단체들은 공무원 및 군대 내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요구하며 평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군 참여 기회는 점차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평등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88년 이전에는 여성 군인이 임신하면 의무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어 강제로 사임해야 했다. 그러나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이러한 차별적 조항이 폐지되어, 현재는 모든 장교와 일등 상사 이상의 부사관에게 임신이 허용된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군의 역할과 책임도 변화했다. 현재 여성 군 입대자들은 남성 입대자들과 동일한 기본 훈련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군인들은 여전히 진급 및 보직 임명 등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남성 동료들과 분리되는 경향도 지적된다. 최초의 여성 장성이 탄생한 것은 2002년 1월이었다.[63]
여군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 기준으로 약 2,100명의 여군이 대한민국 육군에 복무했으며, 이는 전체 군인의 1% 미만이었다.[63] 2010년에는 대한민국 군인의 약 3.5%가 여성이었으며, 2020년에는 약 7,550명의 여성이 군에 복무하여 전체 군인의 약 8.8%를 차지했다.[64]
8. 2. 여성 군인의 역할 확대
대한민국 징병제는 195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8세에서 28세 사이의 남성 시민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여성은 1950년에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 되었으며, 군 복무 의무는 없지만 자원하여 입대할 수 있다.[62]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약 5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자원군이 모든 남성 전투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으나 주로 선전 및 통신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다. 이 자원군은 1951년에 해산되었고 소속 여성들은 제대했다. 이후 1955년에는 여성 군인 훈련을 위한 여군 훈련소가 설립되어 통신, 속기, 타자 업무를 수행할 여성을 모집했다. 당시 군대 내 여성의 수는 제한적이었고, 입대한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여군이 전투에서 남성만큼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부 여성 장교들이 기초 훈련의 신체적 강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980년대 군사 통치에서 민간 통치로 전환되면서 성 관련 문제가 국가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여성 단체들은 공무원 및 군대 내에서 더 많은 여성 대표성을 요구하며 평등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군 참여는 증가했지만, 완전한 평등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88년 이전에는 여성 군인이 임신하면 의무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사임해야 했으나,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모든 장교와 일등 상사 이상의 부사관에게 임신이 허용되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군의 책임과 역할이 크게 변화했다. 현재 여성 군 입대자들은 남성 입대자들과 동일한 기본 훈련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군인들은 여전히 진급 및 임명 과정에서 차별을 겪거나 남성 동료들과 분리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최초의 여성 장성(별 1개)은 2002년 1월에 배출되었다.[63]
여성 군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2년에는 약 2,100명의 여군이 육군에 복무하여 전체 군인의 1% 미만을 차지했지만,[63] 2010년에는 약 3.5%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7,550명의 여성이 군에 입대하여 전체 군인의 약 8.8%를 차지하게 되었다.[64]
8. 3. 군 내 성차별 문제
여성은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군의 일원이 되었다. 약 5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첫 자원군은 모든 남성 전투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으나, 기본적인 군사 훈련만 받고 선전 및 통신 관련 업무만 부여받았다. 이 자원군은 1951년에 해산되었다. 1955년에는 여군 훈련소가 설립되어 통신, 속기, 타자 업무를 수행할 여성을 모집했다. 당시 군대 내 여성의 수는 제한되었고, 남성과 동등한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여군이 전투에서 남성만큼 잘 수행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다.[62]
1980년대 군사 통치에서 민간 통치로 전환되면서 성 관련 문제가 국가 정책의 일부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여성 단체들은 공무원 및 군대 내에서 더 많은 대표성을 요구하며 평등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대표성은 증가했지만, 완전한 평등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8년 이전에는 여성 군인이 임신하면 의무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져 사임해야 했으나,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장교와 일등 상사 이상의 부사관에게 임신이 허용되었다.
1990년 이후,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여군의 책임이 변화했다. 현재 여성 군 입대자들은 남성 입대자들과 동일한 기본 훈련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군인들은 진급 및 임명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남성 동료들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2002년 1월에야 최초의 여성 장교가 별 1개 장성으로 진급했다.[63] 2020년 기준으로 약 7,550명의 여성이 군에 복무하여 전체 군인의 약 8.8%를 차지했다.[64]
9. 여성 대상 범죄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 여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
대표적인 여성 대상 범죄로는 성매매가 있다. 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다.[65][66][67][68][69] 경제적 어려움 등이 성매매 산업의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70][71]
또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공공장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74][75],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77][78]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대상 혐오 표현과 성희롱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이 만연하며[81],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82]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83]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여성 대상 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9. 1. 매춘
대한민국의 매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많은 대한민국 여성과 소녀들이 대한민국의 성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사창가, 사업체, 가정집, 호텔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간을 당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겪는다.[65][66][67][68][69]2003년 금융 위기 회복 이후, 15세에서 29세 사이 여성의 실업률은 12%에 달했다. 2006년에는 20대 여성 실업자가 전체 실업 인구의 40%를 차지했으며, 그 수는 약 34만 명에 이르렀다.[70] 이러한 높은 여성 실업률은 한국 성매매 산업이 성장하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약 5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대략 여성 2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71] 성매매가 만연하면서 에너지 음료인 박카스를 판매하며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년 여성들을 지칭하는 "바쿠스 할머니"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72]
한편, 2013년 6월 대한민국 법은 처음으로 여성을 강간의 주체로 인정했으며, 2015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첫 여성 강간 혐의자가 기소되었다.[73] 전 씨 성을 가진 이 여성은 남성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첫 사례였다.[73]
9. 2. 몰래카메라 범죄
몰래카메라는 대한민국에서 ''몰카''라고 불리며,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는 점점 더 작아졌고, 일부는 볼펜, 열쇠고리, USB 메모리 등 일상적인 물건과 유사하게 위장되어 제작되기도 한다.[74]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는 공중 화장실, 모텔 객실, 심지어 헤어드라이어나 텔레비전과 같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도 설치되어 왔다.[75]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000건 이상의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었다.[75][76]범죄자들은 종종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기도 한다. 촬영 범죄자 중 다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케이팝 스타, 배우, 정부 관리 또는 유명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같이 사회적 명성이나 부를 가진 인물을 특정하여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77]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다.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 음주 문제 등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 불법 촬영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18개월에 불과했으나, 이후 최고 형량이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촬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78]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 수위를 벌금 1000만원 또는 징역 5년으로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79][80] 불법 촬영 범죄 신고 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에는 6,400건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사건만 해도 26,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공중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단속할 정부 인력이 부족하고, 몰래카메라가 주로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설치되었다가 제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숨겨진 카메라를 찾아내고 범죄를 근절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9. 3. 온라인 성희롱
대한민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고정관념, 차별, 비하적이거나 경멸적인 발언이 흔하게 나타나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외모와 나이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나 성기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행위 등이 만연하다.[81] 이러한 행위가 일부 악의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 생산과 유통은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혐오 발언은 여성을 향한 편견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확산된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81]2021년에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이라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했으며, 이를 통해 성적 착취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했다.[82]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불법 촬영물 제작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 접수 시 적극적인 수사 진행, 기술을 활용한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등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82]
2021년 6월 16일, 국제 비정부 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과 입법 기관에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기소율은 43% 이상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 중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83]
9. 4. 디지털 성범죄
대한민국의 온라인 문화에서는 여성을 향한 고정관념, 차별, 비하 발언, 성적 대상화, 외모와 나이에 대한 과도한 집중, 여성을 신체 부위나 성기로 지칭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은 단순히 일부 악의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그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일반화시켜 편견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81]2021년에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이라는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협박했으며, 성적인 착취 장면을 촬영하여 유포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구들은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범죄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불법 촬영물의 온라인 게재를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82]
2021년 6월 16일, 국제 비정부 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내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과 입법 기관에서 종종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기소율은 43% 이상 감소했으며, 2020년에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중 79%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했다.[83]
참조
[1]
웹사이트
Women in Parliaments: World Classification
http://www.ipu.org/w[...]
2016-09-12
[2]
웹사이트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http://stats.oecd.or[...]
OECD
2015-11-30
[3]
웹사이트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https://www3.weforum[...]
World Economic Forum
2023-02-24
[4]
웹사이트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https://hdr.undp.org[...]
HUMAN DEVELOPMENT REPORTS
2022-10-18
[5]
서적
South Korea Women in Culture, Business & Travel: A Profile of Korean Women in the Fabric of Society
World Trade Press
[6]
서적
Under Construction: The Gendering of Modernity, Class, and Consum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7]
웹사이트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https://www.oecd-ili[...]
2021-04-29
[8]
뉴스
Analysis {{!}} Five things to know about women and South Korea's 2020 elections
https://www.washingt[...]
2021-04-26
[9]
뉴스
여성의원 57명 역대 '최다 당선'...여전히 OECD 최하위권
https://www.bbc.com/[...]
2021-04-26
[10]
웹사이트
Home - ILOSTAT - The leading source of labour statistics
https://ilostat.ilo.[...]
2021-04-29
[11]
웹사이트
'"여성 농업인이 52.7%인데 지위낮아"...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팀 올해 상반기내 구성'
https://news.joins.c[...]
2021-04-29
[12]
서적
Women's Experiences and Feminist Practices in South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3]
간행물
Women'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India, Japan and South Korea
2010
[14]
웹사이트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
http://encykorea.aks[...]
2021-04-29
[15]
웹사이트
'태아감별'의 저주...2020년 신랑 100명에 신부 88명
http://www.hani.co.k[...]
2021-04-29
[16]
웹사이트
Son Preference
https://terms.naver.[...]
2021-08-19
[17]
뉴스
Women's Role in Contemporary Korea
https://asiasociety.[...]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KOIS)
2018-02-28
[18]
문서
Tétreault, Mary Ann, ''[https://books.google.com/books?id=X95R043HBJwC&dq=chanyang-hoe+1898&pg=PA163 Women and Revolution in Africa, Asia, and the New World]''
[19]
웹사이트
UNESCO lists Nanjing Massacre and 'comfort women,' China says
http://www.cnn.com/2[...]
Cable News Network,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2015-04-24
[20]
서적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1]
웹사이트
Why Korean Women Opt Out
http://www.worldpoli[...]
World Policy Institute
2015-04-24
[22]
웹사이트
The Empowerment of Women in South Korea
http://jia.sipa.colu[...]
Columbia University SIPA
2015-04-24
[23]
뉴스
A Pram Too Far: Women in South Korea
https://www.economis[...]
The Economist Newspaper Limited
2015-04-24
[24]
간행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한국여성정책의 변화: 대표성 제고 조항을 중심으로
https://khis-primo.h[...]
2021-05-02
[25]
간행물
Gender Equality Legislation in Korea
2016
[26]
웹사이트
Top court recognizes marital rape as crime for first time - YONHAP NEWS
http://english.yonha[...]
2015-08-22
[27]
간행물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https://www.dbpia.co[...]
2021-05-07
[28]
간행물
Gender Perspective and Welfare Policies for Women:Survey Result of Public Officials in Seoul City
https://www.kci.go.k[...]
2021-05-02
[29]
웹사이트
Oxford Art
https://www.oxfordar[...]
[30]
웹사이트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https://www.guttmach[...]
[31]
웹사이트
South Korea's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https://www.hrw.org/[...]
2022-06-09
[32]
간행물
Transition of Son Preference
[33]
뉴스
A win for women's rights: South Korea decriminalizes abortion care
https://www.ippf.org[...]
2021-01-05
[34]
웹사이트
South Korea - Changing Role of Women
http://countrystudie[...]
2018-03-01
[35]
웹사이트
South Korea Literacy - Demographics
https://www.indexmun[...]
2018-03-01
[36]
웹사이트
Education in South Korea » Diversity and Access to Education
http://sites.miis.ed[...]
2018-03-01
[37]
논문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 인권
https://www.dbpia.co[...]
2021-05-02
[38]
뉴스
Court rules: Adultery no longer a crime in South Korea
http://www.cnn.com/2[...]
CNN.com
2015-02-26
[39]
논문
'A room of one''s own': the meaning of spatial autonomy for unmarried women in neoliberal South Korea
http://www.tandfonli[...]
2010-04
[40]
서적
Families: A Social Class Perspective
http://knowledge.sag[...]
SAGE Publications
2012
[41]
웹사이트
2019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gister-based Census)
http://kostat.go.kr/[...]
KOSTAT
[42]
웹사이트
Manager mothers and their impact on Korean society
https://www.korea.ne[...]
Korea.net
[43]
논문
Mothers' Strategies for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Managing the Transition to High School
https://www.jstor.or[...]
JSTOR
1986-07
[44]
논문
Educational Manager Mothers: South Korea's Neoliberal Transformation
https://www.kci.go.k[...]
2007
[45]
뉴스
The glass-ceiling index
https://www.economis[...]
2017-07-13
[46]
웹사이트
South Korea's Woeful Workplace Inequality
https://thediplomat.[...]
2021-02-12
[47]
웹사이트
Gender wage gap - OECD
http://www.oecd.org/[...]
2015-04-09
[48]
논문
한국 여성의 일-가족 갈등 타당화 연구
https://www.dbpia.co[...]
2021-05-07
[49]
논문
Lowest-low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responses.
http://www.popline.o[...]
2015-04-09
[50]
간행물
Women Matter: An Asian Perspective
http://www.mckinsey.[...]
McKinsey & Company
2012-06
[51]
논문
Over-heated education and lower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Korean females in other OECD countries
[52]
뉴스
Low Birthrate Threatens South Korea's Survival
https://learningengl[...]
2021-06-30
[53]
논문
Child Endowments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1976-01-01
[54]
논문
한국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
2021-05-07
[55]
논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사회권을 통해 본 한국의 젠더체제
http://kiss.kstudy.c[...]
2021-05-07
[56]
웹사이트
Testing the Labor Market Dualism in Korea
https://www.bok.or.k[...]
2021-05-07
[57]
논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 격차: 성별 분석을 중심으로
https://www.dbpia.co[...]
2021-05-07
[58]
웹사이트
Shattering South Korea's Ceiling
http://www.newsweek.[...]
2015-04-09
[59]
웹사이트
South Korea Banks Get First Female CEO - Korea Real Time
https://blogs.wsj.co[...]
2015-04-05
[60]
웹사이트
Minari Youn Yuh-jung becomes first Korean actress nominated at Oscar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https://pulsenews.co[...]
2021-05-09
[61]
웹사이트
Yuh-jung Youn makes Oscars history
https://www.cnn.com/[...]
2021-05-09
[62]
웹사이트
S. Korea to expand ratio of female military officers to 8.8 pct
https://en.yna.co.kr[...]
2021-09-09
[63]
논문
Beyond Equality Versus Difference: Professional Women Soldiers in the South Korean Army
https://www.research[...]
2022-10-04
[64]
웹사이트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factors, depress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military women in the Republic of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https://www.research[...]
2022-10-04
[65]
웹사이트
Underage sex trafficking in South Korea getting worse
https://www.asiaone.[...]
2019-04-16
[66]
웹사이트
Police identify 8,000 people in South Korea's sex trade
https://www.pri.org/[...]
2020-04-27
[67]
웹사이트
S. Korea still failing to effectively fight human trafficking
http://english.hani.[...]
2020-04-27
[68]
웹사이트
USFK: Troops cannot pay for the companionship of "juicy girls"
https://www.military[...]
2020-04-27
[69]
웹사이트
USFK video links 'juicy bars' with human trafficking
https://www.stripes.[...]
2020-04-27
[70]
논문
The Paradoxes of Neoliberalism: Migrant Korean Sex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Sex Trafficking"
http://sp.oxfordjour[...]
2015-04-09
[71]
웹사이트
South Korea: A Thriving Sex Industry In A Powerful, Wealthy Super-State
http://www.ibtimes.c[...]
2013-04-29
[72]
뉴스
The Korean grandmothers who sell sex
https://www.bbc.com/[...]
2014-06-10
[73]
웹사이트
Woman charged with rape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AsiaOne Asia News
http://news.asiaone.[...]
News.asiaone.com
2015-04-05
[74]
웹사이트
'"몰카 찾죠?" 먼저 물은 상인... USB형 들고 "이건 안 걸려요" [밀착취재]세계일보'
https://m.segye.com/[...]
2020-06-04
[75]
뉴스
South Korea's spy cam porn epidemic
https://www.bbc.com/[...]
2018-08-02
[76]
뉴스
'Opinion {{!}} A K-pop star''s death is the latest reminder of how Korea''s justice system fails women'
https://www.washingt[...]
[77]
웹사이트
What Is 'Molka' And Why Is It A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https://www.cosmo.ph[...]
2021-01-14
[78]
웹사이트
Will South Korea Finally Have Its Reckoning on Sex Crimes?
https://thediplomat.[...]
The Diplomat
2020-12-10
[79]
웹사이트
Hundreds of motel guests were secretly filmed and live-streamed online
http://www.cnn.com/2[...]
CNN
2019-03-20
[80]
뉴스
Goo Hara and the trauma of South Korea's spy cam victims
https://www.bbc.com/[...]
2019-11-28
[81]
간행물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https://www.dbpia.co[...]
2015
[82]
간행물
A Study of Rational Countermeasures against Digital Sex Crimes: Focus on Article 14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https://www.kci.go.k[...]
2020
[83]
웹사이트
South Korea has a huge problem with digital sex crimes against women says Human Rights Watch
https://www.theregis[...]
2021-08-12
[84]
서적
South Korea Women in Culture, Business & Travel : A Profile of Korean Women in the Fabric of Society
World Trade Press
2010
[85]
서적
Under Construction : The Gendering of Modernity, Class, and Consum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archive.org/[...]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2002
[86]
웹인용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https://www.oecd-ili[...]
2021-04-29
[87]
뉴스
'Analysis {{!}} Five things to know about women and South Korea’s 2020 elections'
https://www.washingt[...]
2021-04-26
[88]
뉴스
여성의원 57명 역대 '최다 당선'...여전히 OECD 최하위권
https://www.bbc.com/[...]
2021-04-26
[89]
웹인용
Home - ILOSTAT - The leading source of labour statistics
https://ilostat.ilo.[...]
2021-04-29
[90]
웹인용
'"여성 농업인이 52.7%인데 지위낮아"…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팀 올해 상반기내 구성'
https://www.joongang[...]
2021-04-29
[91]
웹인용
'"여성 농업인이 52.7%인데 지위낮아"…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전담팀 올해 상반기내 구성'
https://www.joongang[...]
2021-04-29
[92]
서적
Women's Experiences and Feminist Practices in South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2005
[93]
저널
Women'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India, Japan and South Korea
2010
[94]
웹인용
남아선호사상(男兒選好思想)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
2021-04-29
[95]
웹인용
‘태아감별’의 저주…2020년 신랑 100명에 신부 88명
http://www.hani.co.k[...]
2021-04-29
[96]
웹인용
Women's Role in Contemporary Korea
https://asiasociety.[...]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KOIS)
2016
[97]
웹인용
UNESCO lists Nanjing Massacre and 'comfort women,' China says
http://www.cnn.com/2[...]
Cable News Network,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2015-04-24
[98]
서적
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
2008
[99]
웹인용
Why Korean Women Opt Out
http://www.worldpoli[...]
World Policy Institute
2015-04-24
[100]
웹인용
The Empowerment of Women in South Korea
http://jia.sipa.colu[...]
Columbia University SIPA
2015-04-24
[101]
웹인용
A Pram Too Far: Women in South Korea
https://www.economis[...]
The Economist Newspaper Limited
2015-04-24
[102]
저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한국여성정책의 변화 : 대표성 제고 조항을 중심으로
https://khis-primo.h[...]
2012
[103]
뉴스
Court rules: Adultery no longer a crime in South Korea
http://www.cnn.com/2[...]
CNN.com
2015-02-26
[104]
저널
Gender Equality Legislation in Korea
2016
[105]
웹인용
Top court recognizes marital rape as crime for first time - YONHAP NEWS
http://english.yonha[...]
2015-08-22
[106]
웹인용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https://www.dbpia.co[...]
2016
[107]
웹인용
South Korea Decriminalises Abortion: A Historic Moment In Women's Rights
https://www.humanrig[...]
2021-03-26
[108]
저널
Gender Perspective and Welfare Policies for Women:Survey Result of Public Officials in Seoul City
https://www.kci.go.k[...]
2003
[109]
웹인용
South Korea - Changing Role of Women
http://countrystudie[...]
2018-03-01
[110]
웹인용
South Korea Literacy - Demographics
https://www.indexmun[...]
2018-03-01
[111]
웹인용
Education in South Korea » Diversity and Access to Education
http://sites.miis.ed[...]
2018-03-0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