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 일본군인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선적 일본군인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복무한 한반도 출신 군인들을 지칭한다. 1910년 헌병 보조원 제도를 시작으로 육군 특별 지원병, 해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통해 조선인의 일본군 참여가 확대되었다. 약 24만 명의 조선인이 군인 또는 군속으로 동원되었으며, 이 중 2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기도 했다. BC급 전범 재판에서 조선인 12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14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전후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위로금을 지급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인물로는 홍사익, 이응준, 박정희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일본의 군인 - 오타 미노루
지바현 출신 일본 제국 해군 군인인 오타 미노루는 해군병학교 졸업 후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참전, 오키나와 전투에서 해군 근거지대 사령관으로 격렬하게 전투를 지휘하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오키나와 현민의 고통을 호소하는 전보를 남기고 자결, 사후 해군 중장으로 추서되었다. - 일본의 군인 - 소 도신
소 도신은 1911년 일본에서 태어나 만주와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소림사 의화문권 법맥을 계승하여 소림사 권법을 창시했으며, 민족 의식과 조국애를 강조하며 새로운 인간을 육성하려 했다. - 일본의 군사 -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국가적 위기와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A급 전범을 포함한 전쟁 관련 인물들의 합사로 인해 주변국들의 반발을 일으키며 과거사 논쟁의 중심에 있는 신사이다. - 일본의 군사 - 일본국 헌법 제9조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하고, 군사력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하며, 정의와 질서에 기반한 국제 평화를 추구한다. - BC급 전범 - 혼마 마사하루
혼마 마사하루는 일본 제국 육군 군인으로, 필리핀 공략전을 지휘했으나 바탄 죽음의 행진에 대한 책임으로 전범으로 처형되었고, 그의 재판은 지휘자 책임 적용 및 맥아더의 복수심 작용 등의 논란이 있다. - BC급 전범 - 우가키 가즈시게
우가키 가즈시게는 일본 제국의 군인이자 정치인으로, 육군대신과 조선총독을 역임했으며, 군사 개혁을 단행하고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수상 취임에 실패하고 외무대신으로서 중일 전쟁 종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참의원 의원을 지냈다.
2. 일본군 내 조선인
1910년에 창설된 헌병 보조원 제도에서 처음으로 육군에 조선인이 대량 채용되었다. 헌병 보조원은 육군 일등병, 이등병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군속으로 간주되었다. 1919년에 헌병 경찰 제도가 폐지되자 헌병 보조원은 조선총독부 경찰의 경찰관으로 전직했다. 1938년에는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 1943년에는 해군 특별 지원병 제도가 도입되었다.
특별 지원병 제도 시행 이전에는, 조선인이 일반 병졸로서 육해군에 입대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조선인 일본 군인은 홍사익으로 대표되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자, 이병무와 같이 구 대한제국군에서 조선군인으로서 일본 육군으로 전적한 자에 한정되었다. 또한, 해군병학교, 해군기관학교 등의 해군의 장교 양성 학교는, 시종 조선인의 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4년부터는 징병도 실시되었다[1]。
일본 통치하에서 군무에 관계하는 직에 종사하여 전몰자가 된 한반도 출신자 중, 조선인 일본군을 포함한 약 2만 1000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2][3]。이는 일본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시도와 함께, 과거사 청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1990년, 1993년 반환 명부, 당시 후생성[20])의 통계에 따르면, 조선인의 군인 군속은 24만 2,341명이며, 그 중 2만 2,182명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귀국하지 못했다.
BC급 전범 재판의 결과[22], 조선인 출신 12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14명이 사형에 처해졌다[23]。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겪었던 또 다른 비극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문형태 - 육군 상사 (대한민국 육군 대장)
- 표무원 - 육군 군조 (대한민국 육군 소령, 조선인민군 중장)
- 이후락 - 육군 병장 (대한민국 육군 준장,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 중앙정보부 부장, 국회의원)
- 김영길 - 육군 군악대 악수 (가수)
- 양경종 (실존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음)
- 레이라 (소설가)
- 김수환 (후에 추기경, 학도병이었으나 조선인 차별에 항의한 것으로 후보생 자격 박탈[26])
- 이근석 - 육군 준위 (대한민국 공군 준장)
- 이인석 - 육군 상등병, 지원병 최초의 전사자[27]
2. 1. 초기 조선인 일본군
초기에는 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나 구 대한제국 군대 출신들이 일본군에 편입되었다.[16][17][18][19] 일본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와 육군유년학교에서는 조선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만주국군의 조선인 군인도 육군사관학교에 파견 유학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는 만주국군 장교 임관 후,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졸업했다. 반면 해군사관학교는 조선인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다.초기 일본군에 편입된 주요 인물로는 김응선, 김기원, 유동설, 홍사익, 이응준, 김석원, 백홍석, 이종찬, 채병덕 등이 있다.
2. 2. 지원병 제도
1938년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시행되면서 조선인들도 일반 사병으로 일본군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10] 1935년, 중의원 의원 박춘금이 육군대신하야시 센주로에게 조선인 징병 제도를 청원한 것이 시초이다.[10] 1943년에는 해군 특별지원병 제도도 시행되었다.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학도병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1943년, "쇼와 18년도 육군 특별 지원병 임시 채용 규칙"이 공포되어, 한반도 출신으로 재학 징집 연기 제도가 적용되던 문과 계열 대학,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도 학도병으로 지원할 길이 열렸다. 1943년 11월 20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되었는데, 경성제국대학등 적격자 약 1000명 중 90%가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병 제도는 조선 청년들에게 출세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일제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다.[15] 당시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에서 발행한 『특고월보』에는 "응모자는 진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반 강제적으로 권유받아 어쩔 수 없이 응모하는 자이다.", "응모자는 순박한 농촌 청년뿐이며, 유식한 자는 거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좋은 조건에 이끌려, 공리적으로 달려들어 제대 후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기록이 나타난다.[15]
선발 기준은 '사상이 견고하고 체격이 강건하며 정신에 이상이 없는 자' 였다.[5][6] 또한, '전과자, 특히 민족주의자, 공산주의 운동 등에 관계된 자는 이를 채용하지 않으며, 가족 중 주의 운동 등에 관여한 자가 있는 가정의 자는 이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7]
1940년경에는 일본에 비협조적이었던 조선인의 대다수가 협조적으로 전환했다.[11] 당시, 조선인에 의한 일본군 입대를 위한 혈서 제출이 유행하여, 1939년에는 45명, 1940년에는 168명이 혈서를 제출했다.[11]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도 혈서를 제출했으며,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자에 게재되었다.[11][12]
일부에서는 조선 독립을 위해 육군 특별 지원병이 되어 무력을 습득하여 장래 혁명 봉기 시 헌신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13] 또한 "조선인을 지원병으로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즉, 우리는 장래 지원병을 역이용하면 된다. 지원병은 내지인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이러한 우수한 부대에 호소하면 그들은 반드시 조국을 위해 총을 들 것이다. 이 의미에서 지원병은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있었다.[14]
2. 2. 1. 지원 현황
wikitable
2. 3. 징병제
2. 4. 조선인 일본군의 처우
구 일본 육군은 조선 출신 병사의 처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달을 내렸다.[4]- 식습관의 결점은 품성의 도야와 함께 점차 익숙하게 해야 한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이 깊어, 분배의 분량, 부식 등에 대해 덤덤하지 않고, 또한 야외 훈련 등에 있어서 야비한 행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4]
- 조선의 역사, 전통, 풍속, 습관, 생활 양식, 일반 민도, 사상 경향 등을 정상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학교 기타 입대 전 교육의 실정을 파악하여 이를 교육 지도상에 이용하는 것이 극히 긴요하며, 이러한 특성을 곧바로 내지(內地) 사람의 척도로 시비를 가리거나 선입견 및 멸시감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4]
- 조선 출신 병사를 중대 및 내무반 등에 배당함에 있어서는 널리 내지 병사 사이에 흩어지게 하고, 향토적 집결 배당은 극력 이를 피해야 하며, 또한 전우의 선정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4]
- 공문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별히 구별하여 칭호하는 경우에는 반도(의 사람)(출신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본인과 조선인을 대립시키는 듯한 사용은 절대 피하고, 내지인과 조선인(또는 반도인)을 대하게 해야 한다. "선인(鮮人)"이라는 말은 선입견적으로 멸시의 뜻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으나, 조선인이라고 칭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발언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4]
- 상벌의 행사는 특히 공평하고 엄정해야 하지만, 포상의 실시에 있어서는 성격상의 통유적(通有的) 약점에 근거한 심정의 기미를 통찰함과 동시에 징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군기, 풍기적 견지뿐만 아니라 민족적 잠재 의식과의 상관 관계를 중시하고, 징계 후의 지도에 관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4]
일본군은 조선인 병사들의 식습관, 문화적 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기도 했다.[4] 조선인 병사들은 내무반 배치, 칭호 사용 등에서 일본인 병사들과 분리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있었다.[4]
3. 조선인 전범
3. 1. BC급 전범 재판
3. 2. 재판 결과 및 이후 상황
조선인 전범 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는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들은 일본인 전범들과 함께 스가모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가석방된 이후에도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빈곤에 시달렸으며,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생존자들과 그 후손들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오랜 기간 투쟁해왔다. 1991년 11월 12일, 대한민국 국적의 조선인 전 B/C급 전범자 7명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져야 할 전쟁 책임을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1996년 9월 9일 도쿄 지방 법원 1심 판결: 청구 기각
- 1998년 7월 13일 항소심 판결: 원고 측 청구 기각
- 1998년 10월 19일 최고 법원에 상고
- 1999년 12월 20일 최고 법원 판결 선고: 상고 기각, 판결 확정
4. 전후 보상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조선인 일본군인(군속 포함)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실시에 따라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래 대한민국이 보상 의무를 져야 하나, 여러 역사적 경위와 정치적 사정을 고려하여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위금, 위로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 협력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한일 양국 간에 보상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법원은 이러한 조약을 근거로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1991년 11월 12일 한국,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7명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져야 할 전쟁 책임을 대신했다고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 1996년 9월 9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제1심 판결 청구를 전면 기각, 1998년 7월 13일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기각, 1998년 10월 19일 대법원에 상고, 1999년 12월 20일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도 전상 병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쪽 눈의 시력이 시표 0.1을 2미터 이상에서는 변별할 수 없는 자
- 한쪽 귀의 청력을 전혀 잃고, 다른 귀가 보통의 대화를 1.5미터 이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자
- 한쪽 신장을 잃은 자
- 한쪽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잃은 자
- 한쪽 집게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를 완전히 잃은 자
- 한쪽 발목 관절이 직각 위치에서 강직된 자
- 한쪽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히 잃은 자
5. 주요 조선인 일본군 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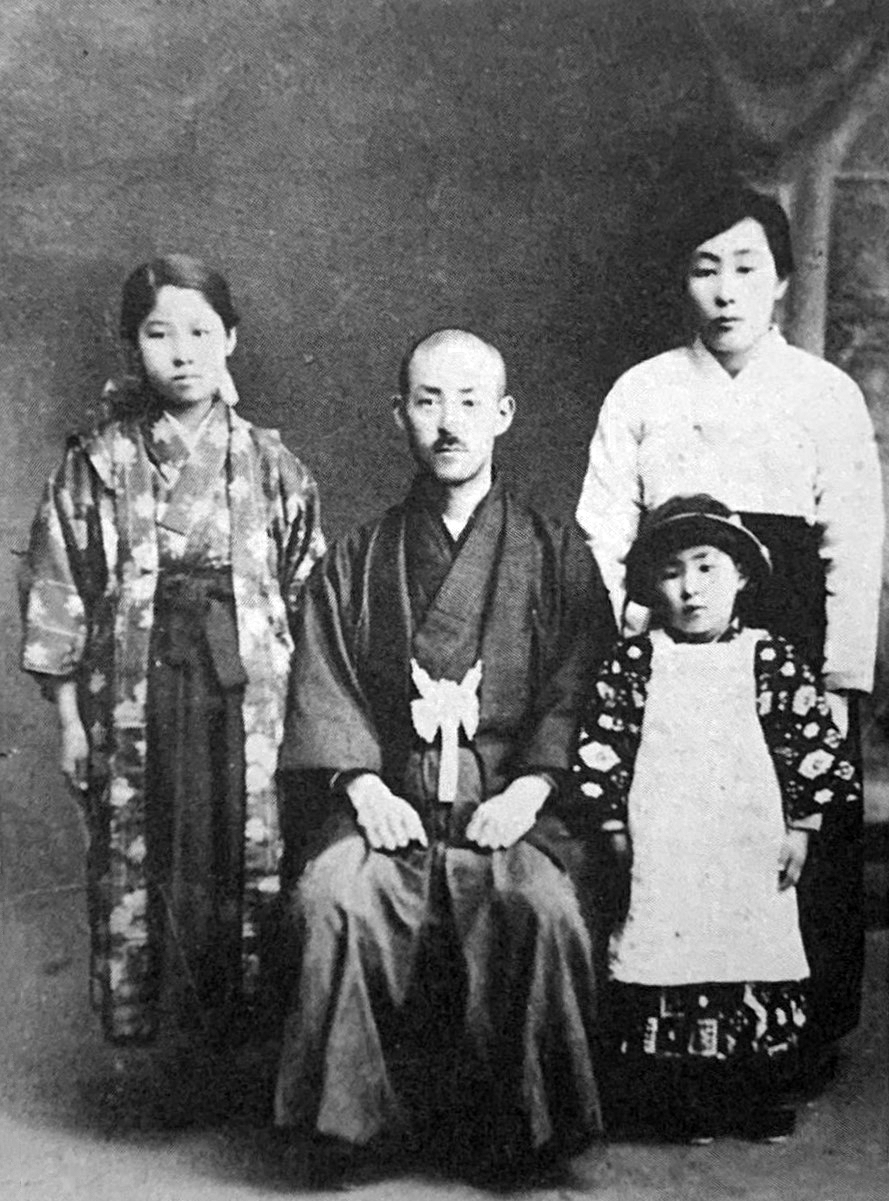
구 일본군 출신 한국인은 일본 통치 종료 후, 한국군의 주력으로서 한국 전쟁 등에서도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제18대(1969년)까지의 한국 육군 참모총장은 모두 구 일본군 출신이 차지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군의 장관, 고급 장교를 역임한 자들은 귀족원 의원, 중의원 의원, 도 지사, 재판관, 조선총독부 고관 등을 지낸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구 일본군의 장교 이상 지위에 있던 자들은 반적 협력자로 거의 숙청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사관 양성 교육을 받은 자들이 조선인민군 장교단의 주축이 되었다.
- 홍사익(洪思翊)은 전범으로 처형되었다. 조동윤(趙東潤), 이병무(李秉武), 조성근(趙性根), 니시카와 당이치 (西川潭一)(어담(魚潭)에서 개명), 이은(李垠) 등이 중장이었다. 이병무는 정미칠적 중 한 명이다. 이은은 이왕이었다.
- 이희두(李煕斗), 우쓰모니야 긴고 (宇都宮金吾) (김응선(金應善)에서 개명), 왕유식(王瑜植) 등이 육군 소장을 역임하였다.
- 이응준 (향산 무준) - 육군 대좌 (대한민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 김석원 (금산 석원) - 육군 대좌 (금치훈장, 대한민국 육군 소장)
- 안병범 (구촌 정신) - 육군 대좌 (대한민국 육군 준장, 한국 전쟁 중 자결)
- 이우한국어 - 육군 대좌 (히로시마 원자 폭탄 투하로 피폭사)
- 이건 (모모야마 겐이치) - 육군 중좌 (이왕가, 일본으로 귀화)
- 백홍석 (도쿠가와 에이이치) - 육군 중좌
- 위량 - 만주국군 중좌[24]
- 백홍석 (도쿠가와 에이이치) - 육군 소좌 (대한민국 육군 준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초대 회장)
- 채병덕 (오오시마 헤이토쿠) - 육군 소좌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2·4대 육군참모총장, 한국 전쟁에서 전사)
- 이종찬 - 육군 소좌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6대 육군참모총장)
- 이형근 (마츠야마 타케오) - 육군 소좌 (대한민국 육군 대장, 제9대 육군참모총장)
- 이용운 (야마모토 류운) - 해군 소좌 (대한민국 해군 중장, 제4대 해군참모총장)
- 김정렬 (향천정웅) - 육군 대위 (대한민국 육군 대장, 제19대 국무총리)
- 정일권 (중도일권) - 만주국군 헌병 대위 (대한민국 육군 대장, 제5대 육군참모총장, 제9대 국무총리)
- 최정근 (고산승) - 육군 중위 (소속된 제66전대에서 "특공전사"로 인정받아, 육군 제6항공군에서 감사장도 받음)[25]
- 김경천 - 육군 중위 (항일 유격대, 소련의 대숙청으로 숙청)
- 지청천 - 육군 중위 (항일 유격대, 대한민국 무임소 장관)
- 박정희 (다카기 마사오) - 만주국군 중위 (대한민국 육군 소장, 대한민국 대통령)
- 백선엽 (시라카와 요시노리) - 만주국군 중위 (대한민국 육군 대장,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 최영희 - 육군 소위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12대 육군참모총장)
- 최경록 - 육군 소위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13대 육군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
- 장도영 - 육군 소위 (대한민국 육군 중장, 제14대 육군참모총장,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 안광호 [
ko] - 육군 소위 (대한민국 육군 준장, 대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 - 탁경현 (광산문박) - 육군 소위 (특공으로 전사. 사후 대위)
5. 1. 중장
홍사익(洪思翊)은 전범으로 처형되었다. 조동윤(趙東潤), 이병무(李秉武), 조성근(趙性根), 니시카와 당이치 (西川潭一)(어담(魚潭)에서 개명), 이은(李垠) 등이 중장이었다. 이병무는 정미칠적 중 한 명이다. 이은은 이왕이었다.5. 2. 소장
이희두(李煕斗), 우쓰모니야 긴고 (宇都宮金吾) (김응선(金應善)에서 개명), 왕유식(王瑜植) 등이 육군 소장을 역임하였다.6. 연표
- 1910년 : 한일강제병합이 이루어졌다.
- 1917년 7월 20일 : 군사부조법이 시행되었다.
- 1918년 : 조선군인 및 조선군인 유족 부조령, 조선군사령부 조례가 시행되었다.
- 1921년 : 조선군 군법 회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1938년 : 육군 특별지원병령 시행 세칙이 공포되었고, 국가총동원법이 조선, 대만, 사할린에 시행되었다. 조선총독부 ·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규정이 제정되었다.
- 1941년 : 조선총독부 상이군인 요양소 관제가 시행되었다.
- 1943년 : 해군 특별지원병령이 공포되었다.
- 1944년 : 조선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 1945년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군사특별조치법, 전시 비상조치법이 조선과 대만에 시행되었다.
- 1946년 : 조선인, 중화민국인, 일본인 및 본적 북위 30도 이남(쿠치노시마도 포함) 가고시마 현과 오키나와 현에 있는 자 등록령이 시행되었다.
- 1951년 9월 8일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 1965년 :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었고,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 1987년 : 대만주민 전몰자의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다.
7. 같이 보기
참조
[1]
뉴스
【あの時代 韓国発 日本統治と私】<7>収奪論 近代化論
http://qnet.nishinip[...]
2010-12-10
[2]
뉴스
Chosun Online|朝鮮日報
http://www.chosunonl[...]
2015-08-21
[3]
뉴스
Chosun Online|朝鮮日報
http://www.chosunonl[...]
2015-08-21
[4]
간행물
朝鮮出身兵取扱教育の参考資料送付に関する件陸軍一般へ通牒
아시아역사자료센터
[5]
논문
朝鮮における志願兵制度の展開とその意義
[6]
웹사이트
半島人志願兵制度愈々きょうより実施
"http://www.lib.kobe[...]
満州日日新聞
2018-11-06
[7]
문서
1937年11月24日朝鮮軍参謀長加納誠一「朝鮮人志願兵問題ニ関スル回答」
[8]
간행물
朝鮮及台湾ノ現状/1 朝鮮及台湾ノ現況 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9]
뉴스
朝鮮の学徒兵志願九割を越す
朝日新聞
1937-11-22
[10]
웹사이트
公文雑纂・昭和十年・第三十一巻・帝国議会六・質問答弁
https://www.digital.[...]
[11]
뉴스
「朴正煕、血書まで書いて日本学校に入学したのは一種の流行」(2)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
2012-04-04
[12]
뉴스
『血書、軍官志願 半島の若き訓導から』
満洲新聞
1939-03-31
[13]
간행물
1938年11月、内務省警保局保安課「特高月報」
[14]
간행물
1941年9月、内務省警保局保安課『特高月報』
[15]
간행물
1941年12月、内務省警保局保安課『特高月報』
[16]
뉴스
일 육사 졸업 뒤 항일연합군 공격“임정 입장서 박정희는 적군 장교”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친일 행적’ 신문 공개
http://www.hani.co.k[...]
2009-12-30
[17]
웹사이트
朴正煕 満州軍官学校 志願の時 "命捧げて忠誠" 血書は事実
http://blog.livedoor[...]
ハンギョレサランバン
2009-12-30
[18]
뉴스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때 “목숨바쳐 충성” 혈서 사실로 민족문제연구소, 당시 신문 공개
http://www.hani.co.k[...]
2009-12-30
[19]
웹사이트
日本陸軍士官学校卒業後 抗日連合軍を攻撃
http://blog.livedoor[...]
ハンギョレサランバン
2009-12-30
[20]
문서
第071回国会 社会労働委員会 第16号 昭和四十八年七月三日(火曜日)午前十一時十五分開会 (参議院)議事録 政府委員答弁より作成
[21]
문서
1990年厚生省
[22]
문서
中国とソビエト分を除く
[23]
문서
ここでは軍人軍属だけを計上している。その他の定義によれば、23人
[24]
웹사이트
満洲国の邦人武官をも襲撃 身をもって免かる
http://www.lib.kobe-[...]
神戸大学
2011-10-02
[25]
뉴스
朝鮮半島の「英霊」達:日本の戦争のために死んだ人々への礼遇と敬意について考える
https://www.huffingt[...]
2015-08-21
[26]
뉴스
8.戦場で(上)
http://www.cpbc.co.k[...]
2018-03-02
[27]
뉴스
発掘沃川現代史- 「兄が利用されたこと...」
http://www.okinews.c[...]
2018-03-02
[28]
웹사이트
한국인 BC급 전범과 전범재판에 대하여 -재판과정을 중심으로-
https://hansung.ac.k[...]
2019-10-01
[29]
뉴스
몇 번 구타로 日 항복 뒤 '전범' 낙인 찍힌 148명 한국인
https://www.pressian[...]
2023-02-25
[30]
뉴스
전범 멍에, 식민지 조선인 모임 동진회의 슬픈 환갑잔치
http://www.yonhapnew[...]
2015-04-01
[31]
뉴스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문제 해결하라”…법률 제정 촉구
https://news.kbs.co.[...]
2022-04-01
[32]
간행물
朝鮮及台湾ノ現状/1 朝鮮及台湾ノ現況 1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33]
문서
第071回国会 社会労働委員会 第16号 昭和四十八年七月三日(火曜日)午前十一時十五分開会 (参議院)議事録 政府委員答弁より作成
[34]
문서
1990년 후생성
[35]
문서
중국과 소련 분 제외
[36]
문서
ここでは군인군속だけを計上している。その他의 정의によれば、23명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