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역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창조'라는 개념이 시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예술은 규칙에 따라 사물을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예술가에게도 자유가 부여되기도 했지만, 기독교 시대에 이르러 창조는 신의 영역으로 한정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가의 창의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17세기에는 시인뿐만 아니라 화가에게도 창조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18세기에는 상상력과 창의성이 연결되었지만,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반대도 있었다. 19세기 이후 예술은 창의성의 주요 발현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20세기에는 과학 분야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통신의 역사 -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는 언어와 기호의 발달에서 시작하여 시각적 표현, 문자의 발명, 인쇄 기술, 통신 기술,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을 거쳐 정보 전달 방식이 진화해 온 과정을 보여준다. - 창조성 -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체제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창조성 - 디자인 싱킹
디자인 씽킹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강조하며 기업 혁신과 교육 분야에서 활용된다. - 철학사 - 마음
마음은 의식, 사고, 지각, 감정, 동기, 행동, 기억, 학습 등을 포괄하는 심리적 현상과 능력의 총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인간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철학사 - 자연철학
자연철학은 현대 자연과학 이전 자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의미하며,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우주와 자연 현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근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자연과학과 분리되었으나, 현대에는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하는 학문으로 재해석된다.
2. 용어 및 개념
고대 그리스에는 "창조하다" 또는 "창조자"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었다. "''poiein''"("만들다")이라는 표현은 시(''poiesis'')와 그것을 만든 ''poietes''(시인 또는 "제작자")에게 특별히 적용되었다.[12] 플라톤은 ''국가''에서 "화가가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으며, "당연히 아니다. 화가는 단지 모방할 뿐이다."라고 대답했다.[12] 고대 그리스인에게 창조자와 창의성의 개념은 행동의 자유를 의미한 반면, 그리스인의 예술 개념은 법과 규칙에 대한 복종을 포함했다. 예술(그리스어로 "''techne''")은 "규칙에 따라 사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스인에게 예술은 창의성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창의성이 포함된 예술은 나쁜 일이었다.[12] 자연은 완전하고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에 복종해야 했다. 예술가는 발명가가 아니라 발견자였다.[13]
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었다. 음악에는 자유가 없었다. 시각 예술에서 자유는 폴리클리투스가 고안한 신체 비율에 의해 제한되었고, 그는 이를 "카논"(canon, "측정"이라는 의미)이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좋은 일을 하려면 영원한 모델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인 키케로는 예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quae sciuntur")을 포용한다고 썼다.[14]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현실의 모방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실에 대한 고착을 요구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도 거짓도 아닌" 것의 영역이었다.[15]
로마 시대에 이러한 그리스 시대의 개념은 부분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호레이스는 시인뿐만 아니라 화가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대담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썼다(''quod libet audendi''). 필로스트라투스는 "시와 예술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들이 상상력을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썼다. 카시오도루스는 "시인과 산문가의 예술 뿐만 아니라 조각가의 손도 신성한 영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썼다. 라틴어는 그리스어보다 "창조"("''creatio''")와 "''창조자''"에 대한 용어가 있었고, "''facere''"와 "''creare''"라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다. 그리스어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poiein''" 하나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라틴어 용어는 거의 같은 것을 의미했다.[16]
이후 기독교 시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creatio''"는 하나님의 "무에서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행위를 뜻하게 되었다. 따라서 ''"creatio"''는 ''"facere"''("만들다")와 다른 의미를 취했고 인간의 기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카시오도루스는 "만든 것과 창조된 것은 다르다. 우리는 만들 수 있지만 누가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17]
르네상스 시대에는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 Marsilio Ficino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생각한다"(''"excogitatio")''라고 썼다. 라파엘로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그림을 형성하였다. 레오나드로 다 빈치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모양"을 사용하였다. 미켈란젤로는 예술가는 자연을 모방하기보다 자신의 비전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조르지오 바사리는 "자연은 예술에 의해 정복된다"고 하였다. 파올로 베로네세는 화가들이 시인, 광인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페데리코 추카리는 예술가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낙원"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체사레 체사리아노는 건축가는 "반신(半神)"이라고 하였다. 요하네스 틴크토리스는 작곡가가 하는 일에 새로움을 요구했고 작곡가를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했다.[19] G.P. 카프리아노는 시인의 발명이 "무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1555).[20]
사르비에프스키는 "마지막 라틴 시인"으로 알려진 17세기 폴란드 시인이자 시 이론가였다. 그는 인간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창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인이 "''새롭게 창조한다'' "("''de novo creat''")라고 썼다. 사르비에프스키는 심지어 "신의 방식으로"("''instar Dei''")라는 말도 추가했다.[21] 그러나 사르비에프스키는 창의성을 시의 독점적인 특권으로 여겼다. 그는 "다른 예술은 단지 모방하고 복제할 뿐 창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다. 앙드레 펠리비엔은 화가가 "말하자면 창조자"라고 썼다. 그라시안은 "예술은 자연의 완성이다, 마치 두번째 신인 듯 한..."이라고도 하였다.[22]
18세기까지 창의성의 개념은 예술 이론에서 더 자주 등장했다. Joseph Addison은 상상력이 "창조와 같은 것을 담고 있다"고 썼다. Voltaire는 "진정한 시인은 창의적이다"(1740)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두 작가의 경우 이는 시인과 창작자 사이의 ''비교에 불과하였다.''[23] 드니 디드로는 상상력은 단순히 "형태와 내용의 기억"이며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관념이 저항에 부딪혔다. 샤를 바퇴는 "인간의 마음은 ''엄밀히 말해서 창조할 수 없으며'', 모든 제품에는 모델의 낙인이 있다."라고 썼다. 뤽 드 클라피에르 보브나르그, Étienne Bonnot de Condillac도 비슷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24]
19세기 예술은 예술을 창의성으로 인식하고자 노력한 이전 세기의 저항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제 예술은 창의성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렇게 여겨졌다.[26] 20세기 전환기에 과학(예: Jan Łukasiewicz)과 자연(예: Henri Bergson)에 대한 창의성의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는 고유한 예술적 개념에서 과학과 자연적 개념으로의 전이로 간주되었다.[28]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J. P. 길포드가 1950년 미국 심리학회에 보낸 연설에서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29]
2. 1. 고대 그리스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창조하다" 또는 "창조자"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었다. "''poiein''"("만들다")라는 표현은 특히 ''poiesis''(시)와 시를 "만든" ''poietes''(시인 또는 "제작자")에게 적용되었으며, 현대적 의미의 일반적인 예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국가에서 "화가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고 "물론 아닙니다. 그는 단지 모방할 뿐입니다."라고 답한다.[1]고대 그리스인에게 창조자와 창의성의 개념은 행동의 자유를 의미했고, 그리스인의 예술 개념은 법과 규칙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다. 예술(그리스어로 "''techne''")은 "규칙에 따라 사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창의성이 없었으며,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볼 때, 창의성이 있었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다.[1]
이러한 예술에 대한 이해는 뚜렷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은 완벽하고 법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인간은 자연의 법을 발견하고 이에 복종해야 하며,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예술가는 발견자였지, 발명가가 아니었다.[2]
이러한 그리스적 견해의 유일한 예외는, 그리고 "중대한" 예외는 시였다. 시인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예술가는 단지 ''모방''할 뿐이었다. 그리고 시인은 예술가와 달리 법에 얽매이지 않았다. "창의성" 또는 "창조자"에 해당하는 용어는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시인은 창조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그렇게 이해되었다. 음악에는 자유가 없었다. 멜로디는 특히 의식과 오락을 위해 규정되었으며, "''nomoi''"("법")로 알려졌다. 시각 예술에서 자유는 폴리클레이토스가 인간의 신체에 대해 정립한 비율에 의해 제한되었고, 그는 이를 "규범"(즉, "척도")이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려면 영원한 모델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대의 로마의 키케로는 예술은 "우리가 아는 것"("''quae sciuntur''")을 포함한다고 기록할 것이다.[2]
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보았다. 오디세이아 1권에서는 "가수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왜 금지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현실의 모방인지, 그리고 진실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오히려 그것은 "진실도 거짓도 아닌" 영역이었다.[3]
2. 2. 고대 로마와 중세 시대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의 창의성 개념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다. 호라티우스는 시인뿐만 아니라 화가도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행동할 권리("quod libet audendi")를 가진다고 썼다. 고대 쇠퇴기에 필로스트라토스는 "시와 예술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들이 상상력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썼다. 칼리스토라토스는 "시인과 산문가의 예술뿐만 아니라 조각가의 손도 신성한 영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상상력과 영감의 개념을 시각 예술에 적용하지 않고 시에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라틴어는 그리스어보다 "창조"("creatio")와 "창조자"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어가 단 하나의 "poiein"을 가지고 있는 반면, "facere"와 "creare"의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어 더 풍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라틴어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를 지녔다.[4]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기독교 시대에 일어났다. "creatio"는 신의 "무에서 창조"("creatio ex nihilo")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다. 따라서 "creatio"는 "만들다"라는 의미의 "facere"와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인간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을 중단했다. 6세기 로마의 관료이자 문학가인 카시오도루스가 썼듯이, "만들어진 것과 창조된 것은 다르다. 우리는 만들 수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5]
이러한 새로운 종교적 표현 해석과 함께 예술은 창의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고대적인 관점이 지속되었다. 이는 두 명의 초기이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인 가짜 디오니시우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볼 수 있다. 13세기의 마오르의 라반과 로버트 그로세테스트와 같은 후기 중세 시대 사람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했다. 중세 시대는 여기서 고대보다 더 나아갔다. 그들은 시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시 역시 규칙이 있었고, 예술이었으며, 따라서 공예였고 창의성이 아니었다.[5]
2. 3.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는 창의성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였다. 철학자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생각해낸다"(''excogitatio'')고 썼고, 건축 및 회화 이론가인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예술가가 작품을 "예정한다"(''preordinazione'')고 보았다.[6] 라파엘로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따라 그림을 형성한다고 했으며,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를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미켈란젤로는 예술가가 자연을 모방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한다고 주장했다.[6]조르조 바사리는 "자연은 예술에 의해 정복된다"고 말했으며, 베네치아의 예술 이론가 파올로 피노는 그림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명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6] 파올로 베로네세는 화가들이 시인과 광인처럼 자유를 활용한다고 보았고, 페데리코 추카리(1542–1609)는 예술가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낙원"을 만든다고 했다. 체사레 체사리아노(1483–1541)는 건축가를 "반신"이라 칭했다.[6] 음악 분야에서 플랑드르 출신의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인 요하네스 틴크토리스(1446–1511)는 작곡가가 하는 일에 참신함이 필요하며, 작곡가를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했다.[6]
시(詩)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은 창의성을 더욱 강조했다. G.P. 카프리아노는 (1555) 시인의 발명이 "무(nothing)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으며, 프란체스코 파트리지(1586)는 시를 "허구", "형성", "변형"으로 간주했다.[7]
2. 4. 17세기
마체이 카지미에시 사르비에프스키(1595–1640)는 17세기 폴란드의 시인이자 시 이론가로, "마지막 라틴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간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창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의 논문인 《완벽한 시에 관하여》에서 그는 시인이 "발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짓는다"고 썼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한다''(de novo creat|데 노보 크레아트la)"고 썼다. 사르비에프스키는 심지어 "신의 방식"(instar Dei|인스타르 데이la)으로 창조한다고 덧붙였다.[7]그러나 사르비에프스키는 창의성을 시의 독점적인 특권으로 여겼으며, 시각 예술가에게는 창의성이 열려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다른 예술들은 단지 모방하고 복제할 뿐 창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하는 재료나 주제의 존재를 가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17세기 말 앙드레 펠리비엔(1619–75)은 화가가 "말하자면 창조자"라고 썼다. 스페인 예수회(Jesuit)의 발타사르 그라시안(1601–58)은 사르비에프스키와 유사하게 "예술은 마치 ''두 번째 창조자''인 것처럼, 자연의 완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썼다.[7]
2. 5. 18세기
18세기 무렵, 창의성의 개념은 예술 이론에서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의성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상상력의 개념과 연결되었다. 조지프 애디슨은 상상력이 "창조와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썼다. 볼테르는 (1740) "진정한 시인은 창조적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두 저자 모두에게 있어서, 이것은 시인을 창조자와의 ''비교''에 불과했다.[8]다른 작가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드니 디드로는 상상력이 단지 "형태와 내용의 기억"일 뿐이며, 결합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할 뿐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반대에 부딪힌 것은 바로 18세기 프랑스였다. 샤를 바퇴는 "인간의 정신은 엄밀히 말해 ''창조할 수 없다''; 모든 결과물은 모델의 낙인을 지니고 있으며, 법의 제약에서 벗어난 상상력으로 발명된 괴물조차도 자연에서 가져온 부분들로만 구성될 수 있다"라고 썼다. 뤼크 드 클라피에, 보브나르그 후작과 에티엔 보노 드 콩디야크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9]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그들의 반대는 세 가지 원천을 가지고 있었다. "창조"라는 표현은 당시 인간에게 접근할 수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 (ex nihilo|엑스 니힐로la)에만 사용되었다. 둘째, 창조는 신비로운 행위이며, 계몽주의 심리학은 신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당시 예술가들은 규칙에 얽매여 있었고, 창의성은 규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후자의 반론은 가장 약했는데, 이는 규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발명''이라는 것을 이미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예: 우다르 드 라 모트, 1715).[9]
2. 6. 19세기 이후
19세기에 예술은 이전 시대에 예술을 창의성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제 예술은 창의성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술만이" 창의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9]예술 교육사에서 자기표현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미술 평론가 존 러스킨이 자주 언급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10]
20세기 초, 과학 분야(얀 루카시에비츠, 1878–1956)와 자연 분야(앙리 베르그송)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이는 일반적으로 예술 고유의 개념을 과학과 자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9]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시작은 때때로 J. P. 길포드가 1950년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한 연설로 간주되는데, 이 연설은 이 주제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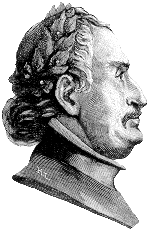
3. 대한민국과 창의성
대한민국 사회에서 창의성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참조
[1]
서적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2]
서적
[3]
서적
[4]
서적
[5]
서적
[6]
서적
[7]
서적
[8]
서적
[9]
서적
[10]
간행물
Genealogy of self-expression: a reappraisal of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in England and Japan
[11]
웹사이트
Guilford's structure of the intellect
http://www.cocreativ[...]
The Co-Creativity Institute
2017-01-20
[12]
서적
A History of Six Ideas: an Essay in Aesthetics
[13]
서적
[14]
서적
[15]
서적
[16]
서적
[17]
서적
[18]
서적
[19]
서적
[20]
서적
[21]
서적
[22]
서적
[23]
서적
[24]
서적
[25]
서적
[26]
서적
[27]
저널
Genealogy of self-expression: a reappraisal of the history of art education in England and Japan
[28]
서적
[29]
웹인용
Guilford's structure of the intellect
http://www.cocreativ[...]
The Co-Creativity Institute
2017-01-2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