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랑주 역학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라그랑주 역학은 뉴턴 역학의 대안으로, 에너지 개념을 기반으로 복잡한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이 역학은 일반화 좌표와 라그랑지언 함수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운동을 설명하며, 최소 작용의 원리를 통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한다. 라그랑주 역학은 뉴턴 역학보다 더 추상적이지만, 구속 조건이 있는 시스템이나 복잡한 좌표계를 가진 문제에 유용하며, 전자기학,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응용된다. 또한, 라그랑주 역학은 뇌터 정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대칭성과 보존량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한다.
라그랑주 함수(라그랑지안, Lagrangian영어)는 물리적인 역학계의 동역학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이다. 라그랑주 역학은 힘 대신 계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운동을 기술한다.
2. 라그랑주 역학의 기본 원리
뉴턴 역학에서는 힘을 사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기술하지만, 라그랑주 역학은 에너지를 기본 요소로 사용하여[5]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6] 라그랑주 역학은 각 물체의 위치와 속도에 대해 독립적인 일반화 좌표를 설정하고, 라그랑지언 (시스템의 총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값)을 최소화하여 일반화된 방정식 세트를 얻는다.[7]
라그랑주 역학은 뉴턴 역학과 달리, 일반화 좌표를 도입하고 에너지 개념을 활용하여 운동을 기술한다.[5] 라그랑지언은 계의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값으로 정의되며, 이 라그랑지언을 모든 가능한 경로에 대해 합한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가 실제 운동 경로가 된다.[7]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속력이 방정식에 직접 나타나지 않게 하여 문제를 간소화한다.
물체의 크기와 모양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질점으로 취급하여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 질량이 , , ..., 인 개의 질점 시스템에서 각 입자는 , , ..., 로 표시되는 위치 벡터를 갖는다. 직교 좌표를 사용하면 ,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3차원 공간에서 각 위치 벡터는 세 개의 좌표로 정의되므로, 시스템의 구성을 정의하는 데 총 3개의 좌표가 필요하다. 각 입자의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와 같이 표현된다.
라그랑주 형식은 일반화 좌표를 사용하며, 좌표 선택은 자유롭다. 뉴턴 역학은 벡터 방정식을 사용하고 데카르트 좌표 외에는 복잡한 좌표 변환이 필요하지만,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라그랑지안이 스칼라 양이므로 좌표 변환이 간단하다.
예를 들어 길이가 일정한 진자가 원주 위를 운동하는 경우, 뉴턴 역학에서는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지만,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일반화 좌표로 각도를 선택하여 하나의 변수로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뉴턴 역학과 라그랑주 역학은 동등하지만, 라그랑주 역학이 더 직접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1. 최소 작용의 원리
속도에 의존하는 비보존력의 경우, 위치와 속도에 의존하는 퍼텐셜 에너지 함수 ''V''를 찾을 수 있다. 일반화된 힘 ''Q''''i''가 다음과 같은 퍼텐셜 ''V''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면,[34][35]
라그랑주 방정식과 같게 하고 라그랑지안을 로 정의하면 '''제2종 라그랑주 방정식''' 또는 운동의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을 얻는다.
그러나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은 위와 같이 퍼텐셜을 찾을 수 있는 경우에만 비보존력을 설명할 수 있다. 비보존력에 대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라그랑주 방정식에는 퍼텐셜이 포함되지 않고 일반화된 힘만 포함되므로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보다 더 일반적이다.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은 변분법에서도 유도된다. 라그랑지안의 ''변분''은
이는 ''L''의 전미분과 유사한 형태를 갖지만, 가상 변위와 그 시간 미분이 미분을 대체하며, 가상 변위의 정의에 따라 시간 증분이 없다. 시간에 대한 부분 적분을 통해 ''δq''''j''의 시간 미분을 ∂''L''/∂(d''qj''/d''t'')로 옮길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d(''δq''''j'')/d''t''를 ''δq''''j''로 교체하여 라그랑지안의 미분으로부터 독립적인 가상 변위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제, 조건 이 모든 ''j''에 대해 성립하면, 적분되지 않은 항은 0이 된다. 또한 ''δL''의 전체 시간 적분이 0이라면, ''δq''''j''가 독립적이고 정적분이 0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피적분 함수가 0인 경우이므로, ''δq''''j''의 계수 각각도 0이어야 한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얻는다. 이것은 '''해밀턴의 원리'''로 요약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의 시간 적분은 작용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양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6]
이는 ''함수형''이다. ''t''1과 ''t''2 사이의 모든 시간에 대한 라그랑지안 함수를 받아 스칼라 값을 반환한다. 그 차원은 각운동량, 에너지·시간, 또는 길이·운동량과 같다. 이 정의를 사용하면 해밀턴의 원리는
으로 표현된다.
외력에 대한 반응으로 입자가 가속되는 것을 생각하는 대신, 위상 공간에서 경로의 끝점을 초기 및 최종 시간에 고정하여 정지 작용을 갖는 경로를 선택하는 입자를 생각할 수 있다. 해밀턴의 원리는 여러 작용 원리 중 하나이다.[37]
역사적으로, 힘에 따라 입자가 따를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찾는다는 아이디어는 1696년 잔 베르누이가 해결한 최속강하곡선 문제와 같은 역학적 문제에 대한 변분법의 첫 번째 적용을 동기 부여했으며, 같은 시기에 라이프니츠, 다니엘 베르누이, 로피탈 그리고 이듬해 뉴턴도 같은 연구를 했다.[38] 뉴턴 자신도 변분 계산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발표하지는 않았다.[38] 이러한 아이디어는 차례로 페르마, 모페르튀이, 오일러, 해밀턴 등의 역학의 변분 원리로 이어졌다.
해밀턴의 원리는 구속 방정식을 좌표의 1차 미분의 특정 형태, 즉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비정홀로노믹 구속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얻어진 구속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재배열할 수 있다.[39]
2. 2. 라그랑주 방정식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
라그랑주 역학에서 운동 방정식을 '''라그랑주 방정식'''(Lagrange's equation영어)이라고 한다. 보존계에서는 라그랑주 방정식을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Euler-Lagrange equation영어)이라고도 부른다.[67]
보통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은 라그랑주 역학에서 문제를 푸는 데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간단히 라그랑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66]
보존계에서 라그랑주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68]
:
여기서,
최소 작용의 원리에 따르면, 작용 범함수가 최소가 되는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운동이다.[61] 작용의 정류 조건에서,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62])이 유도된다.
:
이 방정식은 뉴턴 운동 방정식과 동등하다.
달랑베르는 야코프 베르누이가 정적 평형을 이해하기 위해 도입한 달랑베르의 원리를 발전시켜 동역학 문제를 해결했다.[22] 달랑베르의 원리는 가상 변위 δ'''r'''''k''를 따르는 가상 일이 0이라고 주장한다.[9]
뉴턴 역학에서 운동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 주어지지만, 라그랑주 역학은 힘 대신 에너지를 기본 요소로 사용하여[5]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6] 라그랑주 접근 방식은 일반화 좌표를 설정하여 라그랑지언(시스템의 총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값)의 일반 형태를 작성하고, 이를 최소화하여 일반화된 방정식 세트를 얻는다.[7]
2. 3.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속도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힘 대신 에너지를 기본 요소로 사용하며, 각 물체의 위치와 속도에 대해 독립적인 일반화 좌표를 설정한다.[7] 일반화 좌표는 계의 상태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독립적인 변수들이다.
만약 질량이 있는 물체의 크기와 모양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질점으로 취급하는 것이 유용한 단순화가 된다. 질량이 ''m''1, ''m''2, ..., ''mN''인 ''N''개의 질점 시스템의 경우, 각 입자는 '''r'''1, '''r'''2, ..., '''r'''''N''로 표시되는 위치 벡터를 갖는다. 직교 좌표가 종종 충분하므로 '''r'''1 = (''x''1, ''y''1, ''z''1), '''r'''2 = (''x''2, ''y''2, ''z''2) 등으로 나타낸다. 3차원 공간에서 각 위치 벡터는 한 점의 위치를 고유하게 정의하는 데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므로, 시스템의 구성을 고유하게 정의하는 데 3''N''개의 좌표가 있다. 각 입자의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일반화 속도는 이 일반화 좌표의 시간 변화율이다.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직교 좌표계뿐만 아니라, 문제에 적합한 다양한 일반화 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라그랑주 형식에서, 역학계의 운동 상태를 지정하는 역학 변수는 '''일반화 좌표''' 이다.
3. 라그랑주 함수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 은 일반적으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차이로 정의된다.[8]
:
여기서 는 일반화 좌표, 는 일반화 속도, 는 시간을 나타낸다.
일반화 좌표는 각 물체의 위치와 속도에 대해 독립적인 좌표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총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라그랑지안의 일반 형태를 작성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은 에너지의 단위를 가지지만, 관측 가능한 물리량은 아니다.[61] 그 값 자체에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으며, 동일한 계에 대해 여러 형태의 라그랑지안이 존재할 수 있다.
3. 1. 라그랑지안의 유일성
주어진 계의 라그랑지안은 유일하지 않다. 라그랑지안 *L*에 0이 아닌 상수 *a*를 곱하고 임의의 상수 *b*를 더해도 새로운 라그랑지안 *L*′ = *aL* + *b*는 *L*과 같은 운동을 기술한다. 같은 계를 기술하는 두 라그랑지안은 함수 의 "전시간 미분"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41]
여기서 는 를 의미한다.
두 라그랑지안 *L*과 *L*′은 같은 운동 방정식을 생성한다.[42][43] 라그랑지안은 에너지의 차원을 갖는 스칼라이지만,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 아니며, 그 값 자체에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좌표와 시간의 임의 함수 의 시간에 대한 전미분을 더하는 변환을 하더라도 완전히 같은 역학계를 나타낸다.
4. 라그랑주 역학과 뉴턴 역학의 비교
뉴턴 역학과 라그랑주 역학은 고전역학에서 운동을 기술하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이다. 뉴턴 역학은 뉴턴의 운동 법칙, 특히 제2법칙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기반으로 한다. 3차원 공간에서 질량 m을 가진 입자에 작용하는 힘 '''F'''와 가속도 '''a'''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 방정식은 세 개의 결합된 2계 상미분방정식 시스템으로, 시간 t에서 입자의 위치 벡터 '''r'''을 구하기 위해 풀어야 한다. 이때, 초기 조건에서 '''r'''과 '''v'''(속도)가 필요하다.
뉴턴의 법칙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사용하기 쉽지만, 다른 좌표계에서는 운동 방정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곡선좌표계에서 텐서 지수 표기법을 사용한 뉴턴 법칙은 "라그랑주 형태"[19][20]로 표현된다.
여기서 ''F''''a''는 힘의 반변 성분, Γ''a''''bc''는 2종 크리스토펠 기호, T는 운동 에너지, ''gbc''는 메트릭 텐서의 공변 성분이다.
이러한 표현은 복잡해 보이지만, 크리스토펠 기호에 대한 가속도 성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약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이 없다면, 입자는 가속되지 않고 측지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자유 입자가 곡면 시공간에서 측지선을 따르는 것과 연결된다.[21]
뉴턴 역학에서는 제약 힘 '''C'''와 비제약 힘 '''N'''의 합력 '''F'''를 알아야 한다.
제약 힘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곡선 좌표는 독립적이지 않다.
달랑베르의 원리를 이용하면, 가상 변위 (δ'''r'''''k'')를 일반화 좌표 (''q''j)로 변환하여 제약 힘을 제거하고, 일반화 힘 (''Q''j) 만을 사용하여 운동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라그랑주 방정식'''[29][30] (또는 '''일반화된 운동 방정식'''[31])은 다음과 같다.
이 방정식은 비제약력에 대한 뉴턴의 법칙과 동등하며, 제약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4. 1. 다루는 물리량
뉴턴 역학에서는 외부에서 물체에 미치는 힘에 중점을 두고 벡터량들을 주로 다루지만, 라그랑주 역학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같은 스칼라량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기술하고 있다. 벡터량에 비해 다루기 쉬운 스칼라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에는 뉴턴 역학보다 라그랑주 역학이 더욱 유용하게 쓰인다. 뿐만 아니라, 힘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장의 개념을 포함하는 물리 현상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5]4. 2. 좌표계
뉴턴 역학은 주로 직교좌표계를 사용하여 운동을 기술하지만, 라그랑주 역학은 일반화 좌표계를 사용한다. 일반화 좌표계는 문제에 따라 더 편리한 좌표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 물리학에서 운동 분석을 쉽게 한다.[7] 예를 들어 고리에 매달려 돌아가는 구슬의 움직임을 뉴턴 역학으로 분석하려면 매 순간 고리가 구슬에 미치는 힘을 고려하는 복잡한 방정식을 다뤄야 하지만, 라그랑주 역학에서는 구슬이 고리에 매달린 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경로 중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으면 된다. 따라서 방정식의 수가 줄어든다.[7]뉴턴 역학에서는 운동 방정식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 주어지며, 특히 제2법칙 "알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각 입자에 적용한다. 3차원 ''N''입자 시스템의 경우, 입자 위치에 대한 3''N''개의 2차 상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뉴턴의 법칙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사용하기 쉽지만,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좌표계에서는 운동 방정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곡선좌표계 집합에서 텐서 지수 표기법을 사용한 법칙은 "라그랑주 형태"[19][20]로 표현된다.
일반화 좌표 '''q'''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점 변환에 따라 새로운 일반화 좌표 '''Q'''의 집합으로 변수를 변경하고, 이 변환이 역변환 가능하다면, 새로운 라그랑지안 ''L''′은 새로운 좌표의 함수가 된다. 연쇄 법칙에 의해 라그랑주 방정식은 이 변환에 대해 불변이다.[44] 이는 운동 방정식을 단순화할 수 있다.
4. 3. 철학적 관점
뉴턴 역학은 물체에 미치는 힘이 그에 따른 운동을 일으킨다는 인과론적 관점을 따른다. 즉,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반면, 라그랑주 역학은 운동이 어떤 물리량(작용)을 최소로 유지하며 움직인다는 최소 작용 원리를 따른다. 이 관점에서는 운동이 자연이 가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로 간주된다. 따라서 라그랑주 역학은 목적론적인 역학이라고 할 수 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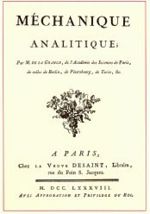
5. 라그랑주 역학의 중요성과 응용
라그랑주 역학은 단순한 실용적 응용을 넘어 물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양자장론 등 현대 이론 물리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최소 작용의 원리와 라그랑주 역학은 뇌터 정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물리적 보존량과 계의 연속적 대칭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9]
라그랑주 함수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보존되는 양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좌표 ''qi''에 대해 "정준적으로 공액인" ''일반화된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만약 라그랑지언 ''L''이 ''qi''에 의존하지 않으면,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에 의해
:
이 성립한다. 즉, 대응하는 일반화된 운동량은 상수이며 보존된다. 이는 뇌터 정리의 특수한 경우이며, 이러한 좌표를 "순환적" 또는 "무시 가능한" 좌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라그랑지언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
여기서 ''r''과 ''z''는 직선 거리, ''s''는 곡선 길이, ''θ''와 ''φ''는 각도이다. ''z'', ''s'', ''φ''는 라그랑지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도는 나타난다. 이 경우, 운동량
:
은 모두 보존된다. ''p''''z''는 ''z'' 방향의 병진 운동량, ''p''''s''는 곡선 ''s''를 따른 병진 운동량, ''p''''φ''는 각도 ''φ''가 측정되는 평면에서의 각운동량이다. 계의 운동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든 좌표와 속도는 이러한 운동량이 보존되도록 변화한다.
5. 1. 다른 분야로의 확장
라그랑주 역학은 물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양자장론은 라그랑지안 밀도를 중심으로 서술되며, 뇌터 정리를 통해 물리적 보존량과 계의 연속적 대칭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양자역학에서 경로적분으로 서술하면 자연스럽게 작용과 라그랑지언이 등장한다. 이에 따라 정상작용원리는 경로적분에서 파동함수의 보강간섭에 의한 고전적 근사라고 할 수 있다.[33] 또한 라그랑주 역학과 뇌터 정리를 이용하면, 물리적 계의 라그랑주 운동방정식의 특정 항들 사이에 교환자를 삽입하여 자연스럽게 양자화할 수 있다.
최소 작용의 원리는 전자기학이나 상대성이론에서도 응용될 수 있으며, 이들 분야의 기본 방정식(맥스웰 방정식,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 계산에서도 라그랑주 형식은 뉴턴 역학보다 편리하다. 예를 들어 길이가 일정한 진자가 원주 위를 운동하는 경우, 라그랑주 형식에서는 일반화 좌표로 각도를 선택하여 한 변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전자기장의 역학 변수는 전자기 퍼텐셜이다. 자유 공간에서 전자기장이 물질과 상호 작용하는 계의 작용 범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X,A] =S_X[X] +S_A[A] +S_\text{int}[X,A]
여기서 SX는 물질의 항, SA는 전자기장의 항, Sint는 전자기장과 물질의 상호 작용 항이며, 전자기장의 항은 다음과 같다.
:S_A[A] = -\frac{1}{4Z_0} \int F^{\mu\nu} F_{\mu\nu}(x) \sqrt{-g}\, d^4x
여기서 F는 전자기장 텐서이다. 이때, 전자기장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frac{\delta S[X,A]}{\delta A_\mu(x)}
=j^\mu(x) +\frac{c}{Z_0} D_\nu F^{\nu\mu}(x) =0
위 식으로부터 맥스웰 방정식이 유도된다.
5. 2. 뇌터 정리와의 관계
라그랑주 역학은 뇌터 정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뇌터 정리는 물리적 보존량과 계의 연속적 대칭성을 연결한다.[9] 예를 들어, 어떤 좌표 ''qi''에 대해 "정준적으로 공액인" ''일반화된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만약 라그랑지언 ''L''이 어떤 좌표 ''qi''에 의존하지 않으면,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에 의해
:
이 성립하고, 적분하면 대응하는 일반화된 운동량이 상수, 즉 보존되는 양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뇌터 정리의 특수한 경우이다. 이러한 좌표를 "순환적" 또는 "무시 가능한" 좌표라고 한다.
예를 들어 라그랑지언이
:
이고, ''r''과 ''z''는 직선 거리를, ''s''는 곡선 길이를, ''θ''와 ''φ''는 각도를 나타낸다고 하자. ''z'', ''s'', ''φ''는 라그랑지언에 없지만 그 속도는 나타난다. 그러면 운동량
:
은 모두 보존된다. 각 일반화된 운동량의 단위와 성질은 대응하는 좌표에 따라 달라진다. ''p''''z''는 ''z'' 방향의 병진 운동량, ''p''''s''는 곡선 ''s''를 따른 병진 운동량, ''p''''φ''는 각도 ''φ''가 측정되는 평면에서의 각운동량이다. 계의 운동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든 좌표와 속도는 이러한 운동량이 보존되도록 바뀐다.
일반화 운동량은 병진 대칭성에서 유도되는 보존량이다.[9] 일반화 운동량을 사용하면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은
:
이 된다.
5. 3. 상대성 이론과의 관계
해밀턴 역학과 달리, 라그랑주 역학은 자연스럽게 상대론적 이론을 다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론적 고전장론에서는 라그랑지언 밀도를 마당과 그 기울기의 함수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최소 작용의 원리를 상대론적 장론 (고전전자기학 등)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상대론적 양자장론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라그랑주 역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힐베르트 작용을 정의 한 뒤 최소 작용의 원리를 적용하여 중력장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라그랑주 역학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라그랑주 역학의 일부 특징은 상대론적 이론에서도 유지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빠르게 나타난다. 특히,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은 같은 형태를 취하며, 순환 좌표와 보존되는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라그랑주 함수는 수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서 퍼텐셜 에너지를 뺀 것이 아니다. 또한, 다입자계를 명백히 공변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특정 기준 좌표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다.[1]
상대론적인 계에서는 시간이 위치와 함께 4원 벡터가 되므로, 시간은 역학 변수가 되고 운동의 매개변수가 되지 않는다. 매개변수를 로 하여, 역학 변수를[1]
로 한다. 여기서 는 시공간의 첨자이고, 는 입자를 구분하는 첨자이다.
자유 입자계를 생각하면, 작용 적분은[1]
이다. 여기서 는 평평한 시공간의 계량이고 이다. 제곱근 안이 양수이기 때문에, 작용 적분 단계에서 운동은 시간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라그랑주 운동 방정식은[1]
이 된다.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평평한 시공간의 측량은 휘어진 시공간의 측량 로 대체되고, 이것이 역학 변수가 된다. 작용 적분은[1]
으로 표현된다. 중력장의 항은
이다. 여기서 은 스칼라 곡률이다.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시공간의 측량 의 운동 방정식으로 유도된다.
5. 4. 순환 좌표와 보존량
라그랑지안이 특정 일반화 좌표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에 대응하는 일반화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러한 좌표를 순환 좌표 또는 무시 가능한 좌표라고 한다.[29][30][31]''qi'' 좌표에 대해 "정준적으로 공액인" ''일반화된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만약 라그랑주 함수 ''L''이 어떤 좌표 ''qi''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으로부터 즉시 다음이 성립한다.
:
그리고 적분하면 대응하는 일반화된 운동량이 상수, 즉 보존되는 양이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네터 정리의 특수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계의 라그랑주 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
여기서 ''r''과 ''z''는 직선을 따라 측정한 길이이고, ''s''는 어떤 곡선을 따라 측정한 호의 길이이며, ''θ''와 ''φ''는 각도이다. ''z'', ''s'', ''φ''는 라그랑주 함수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도는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자. 그러면 운동량
:
은 모두 보존되는 양이다. 각 일반화된 운동량의 단위와 성질은 대응하는 좌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 경우 ''p''''z''는 ''z'' 방향의 병진 운동량이고, ''p''''s''는 곡선 ''s''를 따라 측정한 병진 운동량이며, ''p''''φ''는 각도 ''φ''가 측정되는 평면에서의 각운동량이다. 계의 운동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든 좌표와 속도는 이러한 운동량이 보존되도록 변화할 것이다.
6. 구속계
입자 ''k''에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위치 좌표는 제약 방정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상변위의 좌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일반화 좌표는 독립적이므로, 일반화 좌표에서 가상 변위로 변환하여 ''δ'''''r'''''k''의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다. 이들은 전미분과 같은 형태로 관련되어 있다.[9]
이는 가상 변위이므로 시간 증분에 곱해지는 시간에 대한 편미분은 없다. 즉, 시간의 ''순간''에 제약 조건을 따라 이루어지는 변위이다.
해밀턴의 원리는 구속 방정식을 좌표의 1차 미분의 특정 형태, 즉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비정홀로노믹 구속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39] 해밀턴의 원리는 좌표 *L*이 독립적이지 않더라도(여기서는 r*k*) 여전히 유효하지만, 구속조건은 여전히 정홀로노믹(holonomic)이라고 가정한다.[40] 항상 끝점은 모든 *k*에 대해 고정되어 있다. *δ*r**k*가 독립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δ*r**k*의 계수를 0과 같다고 놓을 수는 없다. 대신, 구속 조건을 포함하기 위해 라그랑주 승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각 구속 조건 방정식에 *i* = 1, 2, ..., *C*에 대해 라그랑주 승수 *λ**i*를 곱하고 결과를 원래 라그랑주 함수에 더하면 새로운 라그랑주 함수를 얻는다.
라그랑주 승수는 시간 *t*의 임의 함수이지만 좌표 r*k*의 함수는 아니므로, 승수는 위치 좌표와 동등한 입장에 있다. 이 새로운 라그랑주 함수를 변분하고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다음을 얻는다.
도입된 승수는 r*k*가 독립적이 아니더라도 *δ*r**k*의 계수가 0이 되도록 찾을 수 있다. 운동 방정식이 따른다. 앞의 분석에서 이 적분의 해를 얻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와 동일하다.
이는 '''제1종 라그랑주 방정식'''이다. 또한, 새로운 라그랑주 함수에 대한 *λ**i*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은 구속 조건을 반환한다.
rk 좌표만의 함수인 퍼텐셜 에너지 *V*의 기울기로 주어진 보존력의 경우, 라그랑주 함수를 대입하면 다음을 얻는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도함수를 (결과적인 힘의) 음수로, 퍼텐셜의 도함수를 비구속력으로 식별하면, 구속력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구속 조건 방정식과 라그랑주 승수를 이용하여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나타낸다.
구속조건이 부과된 계에 라그랑주 형식을 사용할 때, 일반좌표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구속조건이 항상 만족되도록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진자의 예에서는 좌표 변수로 각도를 선택함으로써 길이가 일정하다는 구속조건이 항상 만족되도록 한다.
이 방법 외에도, 라그랑주 승수법을 사용하여 작용범함수(라그랑주 함수)에 구속조건을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일반화좌표에 대해, 구속조건
이 부과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작용은
에 의해 구속조건이 포함된다. 여기서 도입된 가 라그랑주의 미정승수이다. 구속조건은 모든 시간에 대해 성립하므로, 미정승수도 각 시간에 대해 도입되는 시간의 함수이다.
구속조건이 포함된 작용에 대해 최소 작용의 원리를 적용하면
을 얻는다. 역학변수 에 대응하는 운동방정식에는 “구속력”이 더해지고, 미정승수에 대응하는 운동방정식으로 구속조건이 유도된다.
7. 라그랑주 역학의 다양한 표현
라그랑주 역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해밀턴 역학은 라그랑주 역학과 동등한 또 다른 고전 역학 형식이며,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 서로 변환할 수 있다. 해밀토니안은 라그랑지안에 대한 르장드르 변환으로 얻어지며, 일반화된 좌표에 정준적으로 공액인 일반화된 운동량을 도입한다. 이는 변수의 수를 두 배로 늘리지만, 미분 방정식을 1계로 만든다.[36] 해밀토니안은 양자 역학에서 널리 사용된다.[36]
루스 역학은 라그랑주 역학과 해밀턴 역학을 혼합한 형태이지만, 순환 좌표에 대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라그랑주 역학은 장의 이론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고전적인 장 이론에서 물리적 계는 이산적인 입자들의 집합이 아닌 3차원 공간에 정의된 연속적인 장으로 나타낸다. 이 경우 라그랑지안 밀도는 위치 '''r'''과 시간 ''t''에서 장과 그 공간 및 시간 미분으로 정의된다. 라그랑지안은 3차원 공간에 걸쳐 라그랑지안 밀도를 부피적분하여 얻는다.[39]
상대론적인 장의 이론에서는 라그랑주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상대론적 불변성 등의 대칭성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63] 예를 들어, 전자기장의 역학 변수는 전자기 퍼텐셜이며, 자유 공간에서 전자기장이 물질과 상호 작용하는 계의 작용범함수는 물질 항, 전자기장 항, 상호 작용 항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로부터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7. 1. 해밀턴 역학과의 관계
해밀턴 역학은 라그랑주 역학과 동등한 또 다른 고전 역학 형식이다.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 라그랑주 역학과 해밀턴 역학을 서로 변환할 수 있다.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6]:
이는 라그랑지안에 대한 르장드르 변환을 수행하여 얻을 수 있으며, 원래 변수에 정준적으로 공액인 새로운 변수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일반화된 좌표 집합이 주어지면, 정준적으로 공액인 변수는 일반화된 운동량이다. 이는 변수의 수를 두 배로 늘리지만, 미분 방정식을 1계로 만든다. 해밀토니안은 양자 역학에서 특히 널리 사용되는 양이다(해밀토니안 (양자 역학)).[36]
루스 역학은 라그랑주 역학과 해밀턴 역학의 혼합된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순환 좌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형태이다.
해밀턴 형식과 라그랑주 형식은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 등가이다. 단, 라그랑지안이 축퇴되어 있는 경우에는 르장드르 변환이 미분 동상 사상이 되지 않아 라그랑주계에서 해밀턴계로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이 축퇴된 경우에 대한 처방으로 폴 디랙의 구속 이론이 알려져 있다.[39]
7. 2. 장의 이론에서의 라그랑지안
고전적인 장 이론에서 물리적 계는 이산적인 입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3차원 공간 영역에 정의된 연속적인 장이다. 이 장과 연관된 것은 위치 '''r'''과 시간 ''t''에서 장과 그 공간 및 시간 미분으로 정의된 라그랑지안 밀도이다.입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비상대론적 응용에 대해 라그랑지안 밀도는 장의 운동 에너지 밀도에서 위치 에너지 밀도를 뺀 값이다(이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라그랑지안 밀도는 "역으로 설계"되어야 한다).[39] 그러면 라그랑지안은 3차원 공간에 걸쳐 라그랑지안 밀도의 부피적분이다.
여기서 d3'''r'''은 3차원 미분 체적 요소이다. 라그랑지안 밀도가 장을 통해 암시적인 공간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명시적인 공간 의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은 시간의 함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적분에서 제거되어 라그랑지안에 대해 시간만 변수로 남는다.
특히 상대론적인 장의 이론의 경우에는 라그랑주 형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론적 불변성 등의 대칭성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63]
역학 변수로는 장 를 생각한다. 작용 적분은 '''라그랑지안 밀도''' 에 의해
로 쓰여진다. 그 변분은
이 되고, 라그랑주의 운동 방정식으로서
이 얻어진다.
전자기장의 역학 변수는 전자기 퍼텐셜 이다. 자유 공간에서 전자기장이 물질 과 상호 작용하는 계의 작용범함수는
의 형태로 쓰인다.
여기서 는 물질의 항, 는 전자기장의 항, 는 전자기장과 물질의 상호 작용 항이며, 전자기장의 항은
로 쓰인다. 여기서 는 전자기장 텐서이다.
이때, 전자기장 에 대한 운동 방정식
으로 맥스웰 방정식이 유도된다.
8. 비보존력의 포함
라그랑주 역학은 소산력과 같은 비보존력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일반화된 힘 $Q_j$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면,[32]
여기서 $V$는 위치와 속도에 의존하는 퍼텐셜 에너지 함수이고, $D$는 레일리 소산 함수(Rayleigh dissipation function)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60]
$C_{jk}$는 물리계의 감쇠 계수와 관련된 상수이다.
이 경우 라그랑주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60]
레일리 소산 함수는 에너지 소산을 기술하는 데 사용된다.
9. 예제

뉴턴의 법칙은 단순화를 위해, 일반성을 크게 잃지 않고 하나의 입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N개의 입자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모든 방정식은 시스템의 각 입자에 적용됨). 1687년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일정한 질량 m을 가진 입자의 운동 방정식은 현대 벡터 표기법으로 다음과 같다.
:
여기서 '''a'''는 입자의 가속도이고 '''F'''는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이다. 질량이 변하는 경우, 운동량의 시간 미분을 고려하도록 방정식을 일반화해야 한다. 3차원 공간에서 이 벡터 방정식에는 세 개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결합된 2계 상미분방정식 시스템을 풀어야 한다. 해는 시간 t에서 입자의 위치 벡터 '''r'''이며, 일 때 '''r'''과 '''v'''의 초기 조건을 따른다.
뉴턴의 법칙은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사용하기 쉽지만, 항상 편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좌표계의 경우 운동 방정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인 곡선좌표계 집합에서, 텐서 지수 표기법을 사용한 법칙은 "라그랑주 형태"[19][20]이다.
:
여기서 ''F''''a''는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의 ''a''번째 반변 성분이고, Γ''a''''bc''는 2종 크리스토펠 기호이며,
:
는 입자의 운동 에너지이고, ''gbc''는 곡선 좌표계의 메트릭 텐서의 공변 성분이다. 모든 지수 a, b, c는 각각 값 1, 2, 3을 가진다. 곡선 좌표계는 일반화 좌표계와 같지 않다.
뉴턴의 법칙을 이러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운동 에너지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대신 크리스토펠 기호에 대한 가속도 성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자에 작용하는 합력이 없다면 (), 입자는 가속되지 않고 직선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는 수학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해가 공간의 두 점 사이의 길이가 극값인 곡선인 측지선임을 의미한다(최단 경로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평평한 3차원 실 공간에서 측지선은 단순히 직선이다. 따라서 자유 입자의 경우, 뉴턴의 제2법칙은 측지선 방정식과 일치하며, 자유 입자는 움직일 수 있는 극값 궤적을 따른다. 입자가 힘의 영향을 받는 경우 (), 입자는 작용하는 힘으로 인해 가속되고 자유로운 경우 따랐을 측지선에서 벗어난다. 평평한 3차원 공간에서 주어진 양을 4차원 곡면 시공간으로 적절히 확장하면, 뉴턴 법칙의 위 형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자유 입자는 더 이상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선"이 아닌 곡면 시공간에서 측지선을 따른다.[21]
하지만 여전히 입자에 작용하는 총 합력 '''F'''를 알아야 하며, 이는 제약이 없는 힘 '''N'''과 제약 힘 '''C'''의 합력을 필요로 한다.
:
제약 힘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다. 또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곡선 좌표는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 이상의 제약 방정식으로 연결된다. 제약 힘은 운동 방정식에서 제거하여 제약이 없는 힘만 남기거나, 제약 방정식을 운동 방정식에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
이후에는 라그랑주 방정식 제2종을 이용해 역학 문제를 푸는 예시를 제시한다. 질량이 ''m''인 입자가 스칼라 퍼텐셜의 기울기 ∇에서 유도된 보존력의 영향 아래 움직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입자가 여러 개인 경우, 총 운동 에너지는 모든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고, 퍼텐셜은 모든 좌표의 함수이다. 구체적인 예시는 하위 섹션인 "자유 낙하"와 "단진동 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1. 자유 낙하
점질량 ''m''이 중력 가속도 ''g''를 받으면서 자유 낙하하는 상황을 라그랑주 역학을 이용해 풀어볼 수 있다. 일반화 좌표는 ''x'' 하나이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라그랑지언은 다음과 같다.
:
여기에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을 쓰면 다음과 같다.
:
따라서 다음을 얻는다.
:
이는 뉴턴 역학에서의 결과와 같다.
9. 2. 단진동 운동
상수가 k로 주어지는 단진동 운동의 라그랑지언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일반화 좌표를 진동의 원점에서 움직인 거리 x로 놓고 오일러-라그랑주 방정식을 풀면,
:
이 되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19][20]
참조
[1]
논문
J. L. Lagrange's Early Contributions to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Mechanics
http://www.jstor.org[...]
2023-11-03
[2]
harvnb
[3]
harvnb
[4]
harvnb
[5]
저널
Teaching Energy Before Forces
https://physics.aps.[...]
2024-09-27
[6]
웹사이트
Lagrangian mechanics
https://www.astro.uv[...]
2024-09-27
[7]
서적
50 ideas you really need to know : science
Quercus
[8]
harvnb
[9]
harvnb
[10]
저널
Synchronous Lagrangian variational principles in General Relativity
https://link.springe[...]
[11]
논문
Lagrangian descriptions of dissipative systems: a review
[12]
harvnb
[13]
서적
Constraint Systems
https://link.springe[...]
Springer
2024-09-23
[14]
harvnb
[15]
문서
variational derivative
[16]
harvnb
[17]
harvnb
[18]
웹사이트
Chapter 6: The Lagrangian Method
https://scholar.harv[...]
[19]
harvnb
[20]
harvnb
[21]
harvnb
[22]
harvnb
[23]
harvnb
[24]
문서
Udwadia–Kalaba equation
[25]
harvnb
[26]
문서
[27]
harvnb
[28]
harvnb
[29]
harvnb
[30]
harvnb
[31]
harvnb
[32]
harvnb
[33]
서적
The Road to Reality
Vintage books
[34]
harvnb
[35]
harvnb
[36]
논문
[37]
논문
Variational mechanics in one and two dimensions
https://pubs.aip.org[...]
2005-07-01
[38]
논문
[39]
논문
[40]
논문
[41]
논문
[42]
논문
[43]
논문
[44]
논문
[45]
논문
[46]
논문
[47]
서적
Classical and Quantum Dynamics of Constrained Hamiltonian Systems
https://www.worldsci[...]
WORLD SCIENTIFIC
[48]
논문
[49]
논문
[50]
문서
The Lagrangian also can be written explicitly for a rotating frame. See Padmanabhan, 2000.
[51]
논문
[52]
논문
[53]
논문
[54]
논문
[55]
논문
[56]
논문
[57]
논문
[58]
논문
[59]
논문
[60]
논문
[61]
문서
実際は極小値。計算上は停留条件が用いられる。
[62]
문서
オイラー=ラグランジュ方程式やオイラー方程式という用語は、運動方程式以外でも用いられる用法である。
[63]
문서
清水(2004)
[64]
서적
微分形式による解析力学
吉岡書店
[65]
서적
Mécanique analytique
Courcier
[66]
서적
Classical Mechanics
Thompson Brooks/Cole
[67]
웹사이트
Lagrange's Equations -- from Eric Weisstein's World of Physics
http://scienceworld.[...]
[68]
서적
개정판 고전역학
서울대학교출판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