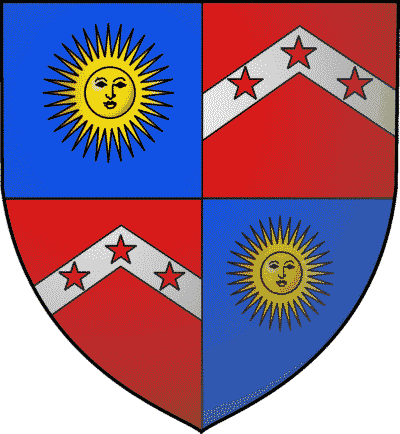후작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후작(Marquess/Marquis)은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작위로, 국경 지역을 통치하는 귀족을 의미한다.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주나라 시대부터 존재했다. 서양에서는 변경 영지를 소유하고 국경을 수비하는 귀족을 지칭했으며, 프랑스, 영국,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는 공작 다음, 백작 위의 지위이며, 스페인에서는 공작 다음의 귀족 서열을 갖는다.
'마르퀴스(marquess)'라는 단어는 13세기 말 또는 14세기 초에 고대 프랑스어 마르시/marchisfro ("국경 지역의 통치자")에서 영어로 유입되었다. 이 프랑스어 단어는 마르슈/marchefro ("국경")에서 파생되었으며, 이는 다시 중세 라틴어 marcala ("국경")에서 파생되었다. 변경백 및 이탈리아 왕국에서 marchese는 현대 영어 단어 'march' 역시 파생되었다. 국경 영토의 통치자와 내륙 영토의 통치자 간의 구별은 로마 제국 창립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일부 속주는 원로원에 의해 행정적으로 관리되었고, 더 불안정하거나 취약한 속주는 황제에 의해 관리되었다. "공작"과 "백작"이라는 칭호는 비잔틴 제국에서 유사하게 구별되었으며, duxla(문자 그대로 "지도자")는 지방 군사 총독에게 사용되었고, comesla(문자 그대로 "동반자", 즉 황제의)라는 계급은 국경을 따라 활동하는 군대의 지도자에게 주어졌다.
주로 중국에서 봉작된 경우가 많은 작위로 진나라 이전까지 존재한 군국제의 특성상 방백의 지위를 누렸던 작위이다.
서양에서 후작은 본래 변경 영지를 소유하고 국경을 수비하는 귀족을 지칭했다. 8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카롤링거 왕조의 후작은 국경 수비 임무를 맡은 왕실 관리였다. 이들은 백작은 하나 이상의 영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제외되어 그 지위가 공작에 못지 않았다. '변경공'(Markherzog)이라는 칭호가 '변경백'(Markgraf)을 대신해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의 조건과 국경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옛 경계지역의 중요성이 상당히 감소했다.
2. 어원
3. 동양
## 중국
중국에서의 후작 작위는 동주 시대부터 존재했다.[7] 건국 공신인 여상이 봉작된 제와 주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분봉받은 노(주공은 공의 작위를 받았으나, 그 후손은 후의 작위를 받았다) 등이 후작 작위를 갖고 있었다. 주 왕실과 같은 성씨인 정나라를 제외하고는 동성 제후만이 후작에 봉해질 수 있었다. 제후가 아닌 경우, 주나라 왕실에서 경사로 일하는 인물만이 후작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직책이었다.[7]
『예기』에는 "왕자의 제록작(王者之制祿爵), 공후백자남 범오등(公侯伯子男 凡五等)"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후(侯)"는 다섯 개의 작위 중 두 번째에 위치한다。 반면에 『맹자』 만장하에는 "천자지경(天子之卿), 수지시후(受地視侯), 대부수지시백(大夫受地視伯), 원사수지시자남(元士受地視子男)"이라고 하여, 천자를 작위의 으뜸으로 칭하고, 후는 영지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기』, 『맹자』와 함께 후는 공과 함께 백 리 사방의 영지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춘추공양전』에는 "천자는 삼공을 공이라 칭하고, 왕자지후는 공이라 칭하고, 그 외의 대국은 후라 칭하고, 소국은 백, 자, 남이라 칭한다"는 삼등 작위제가 기술되어 있다。 금문 사료가 검토되면서 푸치니안、궈모뤄、양슈다와 같은 연구자들은 오등 작위 제도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후세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보았다。 왕스민이 금문 사료를 검토했을 때 공, 후, 백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했지만, 자와 남에 관해서는 실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전한 시대에는 왕작의 도입으로 거의 유명무실해졌으며, 후한 시대에 후작 지위가 확대되어 현후, 향후, 정후로 구분되었고, 후기에 들어서 허봉이 되었다. 위의 함희 원년(264년), 작위 제도가 개혁되어 후의 작위가 부활했다. "공후백자남"의 작위는 열후와 정후 위에 위치하며, 제후왕의 아래 지위가 된다。 식읍은 대국이면 천육백 호, 칠십 리 사방의 토지, 다음 나라는 천사백 호, 육십오 리 사방의 토지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서진에서도 작위 제도는 존속했고,혜제 이후에는 공, 후의 남발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동진에서는 혜제 시대의 작위를 강등하기도 했다。
함희(咸熙) 원년의 오등작제 발족 당시, 삼공이었던 왕상, 정충, 그 외의 중신 가충, 석포, 위관, 배수, 하증 등이 후작이 되었으나, 진 왕조 성립 후에는 모두 공으로 진급하였다。 또한 당시 진왕 사마소의 동생이었던 사마준도 '후'의 작위를 받았으나, 진 왕조 성립 후에는 제후왕이 되었다。
태강의 역의 논공행상으로, 두예, 왕준, 당빈, 왕융과 같은 군사 사령관이나 오나라 토벌을 권유한 장화가 후작의 작위를 받았다[18]。 이들 전역의 공로자에게는 규정을 초과한 식읍도 주어졌다. 장화에게는 1만 호, 두예에게는 9천 6백 호의 식읍이 내려졌다。 또한 양호는 무제 수선 시에 자작에서 후작으로 진급하였다。 그 외에 서진 멸망 당시의 태위 왕연도 후작(무릉후)이었다。
남북조 시대에서도 진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서작이 행해졌다. 수나라에서는 국왕, 군왕, 국공, 현공, 후, 백, 자, 남의 작위가 설치되었고, 당나라에서는 왕, 개국국공, 개국군공, 개국현공, 개국후, 개국백, 개국자, 개국남의 작위가 설치되었다.[7] 이후 여진족이 건국했던 청나라가 신해혁명으로 1912년에 몰락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봉건 제도하의 5등작 중에서 제2위의 작위명이다.
## 한국
고려 때의 후작은 오등작 중 두번째 작위로, 천자의 종실 제후는 부여후, 조선후와 같이 주로 국명과 함께 oo후로, 이성제군은 낙랑군개국후(김부식), 천수현개국후(강감찬)와 같이 지명과 함께 oo군후, oo현후 등으로 봉해졌다. 이 후 몽골 간섭기에 황제국 제도가 격하되어 봉작제가 폐지되었고 후작 역시 사라졌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 이성계의 부마 심종이 청원후(靑原侯)에 봉해지는 등 종친과 부마를 후작에 봉하기도 하였으나[19] 태종 때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종친과 부마(왕의 사위), 조선의 부원군 중에서도 국구(왕의 장인)가 후작에 해당된다.
### 일제강점기
한일병합 이후 일제가 내린 조선귀족 중 후작은 총 7명이었다. 이 중 왕족 및 왕가의 인척이 아닌 이로는 박영효가 유일했으나 그 역시 철종의 딸인 영혜옹주와 결혼한 관계로 결론적으로 보면 왕가쪽 사람이다.[19]
한일 병합 이후 1910년의 조선귀족령(황실령 제14호)에 의해 화족에 준하는 조선귀족 제도가 마련되었다. 조선귀족에게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오작이 존재했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공작에 서임된 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조선귀족의 실질적인 최상위 작위는 후작이었다. 조선귀족의 작위는 화족에서의 동등한 작위와 대등한 입장에 있었지만, 귀족원 의원이 될 특권이 없다는 점이 화족과 달랐다.
조선귀족의 작위는 가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일 병합에서의 훈공 등에 대해 주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훈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대신급의 정치가나 군인이었던 자뿐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최상위 귀족 계급이었던 양반 출신으로 채워졌다.
조선귀족의 작위에 서임된 자는 전부 76명이며, 그 중 후작에 서임된 것은 다음 6명이다. 흥선대원군의 조카로 궁내부대신이나 육군 부장, 한성은행 행장 등을 역임한 이재완, 주일 대사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이재각, 중추원 의관이었던 이해창, 이왕가의 연지(連枝)로 시강원 시종관을 지낸 최연소의 이해승, 순종 비의 부친으로 시강원 시종관, 영친왕부 총변, 육군 부장을 역임한 윤택영, 그리고 박영효이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박영효이다. 그는 혈통이 좋고 아내가 25대 국왕 철종의 딸이라는 점으로 정치의 중추에 들어가, 김옥균과 함께 "개화파"로서 일본을 본뜬 조선 근대화를 추진했으며, 김홍집 내각이나 이완용 내각 등 친일 정권의 내부 대신이나 궁내 대신을 지냈다. 병합 후에도 조선귀족회 회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칙선 의원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명해졌다. 또한 한일 병합 당시의 한국 총리인 이완용은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했다.
이들 중 이완용, 박영효, 윤택영 등은 일제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것이기에, 민족 반역자로 간주되어 현재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의 친일 행적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에게 부여된 후작 작위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고 비판한다.
## 일본
일본에서 후작은 메이지 시대에 도입된 화족 제도에서 공작 다음가는 지위였다.[9] 청화가, 도쿠가와 고산케, 15만 석 이상의 다이묘, 류큐 왕가 출신, 그리고 국가에 공을 세운 자들(사이고 주도, 이노우에 가오루, 노즈 미치츠라, 고무라 주타로, 사사키 다카유키, 오쿠마 시게노부, 도고 헤이하치로 등)에게 수여되었다.[7] 다른 작위들과 마찬가지로,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인해 화족 제도가 폐지되면서 후작 작위도 함께 사라졌다.
1884년(메이지 17년) 5월경 훈공국 총재 야나기하라 마에미츠 등에 의해 각 가문의 서작 기준이 되는 서작 내규가 정해졌고, 기존의 화족(구 화족)에 더해 훈공자나 신적 강하한 황족도 서작 대상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7월 7일에 발효된 화족령에 의해 오작제에 기초한 화족 제도의 운용이 시작되었다.
후작은 공작 다음으로 두 번째이며, 서작 내규에서는 후작의 서작 기준에 대해 "구 세이카 가 도쿠가와 구 삼가 구 다이한 지사 즉 현미 15만 석 이상 구 류큐 번왕 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라고 규정했다. 후작가의 수는 1884년 시점에서는 24가(화족가의 총수 509가), 1895년에는 34가(동 643가), 1916년 시 38가(동 933가), 1928년 시 40가(954가), 1947년 시 38가(889가)였다.
1889년(메이지 22년) 귀족원령에 의해 귀족원 의원의 종류로서 화족 의원이 설치되었고, 공작, 후작은 만 25세(다이쇼 14년 이후는 만 30세)에 달하면 자동으로 종신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이에 반해 백작 이하는 동작자 간의 연기·기명 투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만이 임기 7년의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또한 공작, 후작 의원이 무급이었던 반면, 백작 이하의 의원은 유급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작, 후작 의원은 백작 이하의 의원들만큼 귀족원 활동에 열심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고, 본회의 출석률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현역 군인인 공작, 후작 의원은 황족 의원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정치 불간여의 원칙에 따라 귀족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구로다 나가나리 후작, 사사키 유키타다 후작, 호소카와 모리타츠 후작 등 대표적인 귀족원 정치가로서 활약한 후작도 있다.
역대 귀족원 의장은 이토 히로부미 백작과 마츠다이라 요리히사 백작을 제외하고 전원이 공작, 후작이었으며, 귀족원 부의장도 공작, 후작이 많았다. 귀족원 내에는 작위별로 회파가 형성되었지만, 공작, 후작은 오랫동안 각 파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7년(쇼와 2년)에는 고노에 후미마로 공작의 주도로 "화요회"라는 공작, 후작 의원에 의한 원내 회파가 형성되었다.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제14조에서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후작위를 포함한 화족 제도는 폐지되었다.
3. 1. 한국
고려 때의 후작은 오등작 중 두번째 작위로, 천자의 종실 제후는 부여후, 조선후와 같이 주로 국명과 함께 oo후로, 이성제군은 낙랑군개국후(김부식), 천수현개국후(강감찬)와 같이 지명과 함께 oo군후, oo현후 등으로 봉해졌다. 이 후 몽골 간섭기에 황제국 제도가 격하되어 봉작제가 폐지되었고 후작 역시 사라졌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 이성계의 부마 심종이 청원후(靑原侯)에 봉해지는 등 종친과 부마를 후작에 봉하기도 하였으나[19] 태종 때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종친과 부마(왕의 사위), 조선의 부원군 중에서도 국구(왕의 장인)가 후작에 해당된다.
한일병합 이후 일제가 내린 조선귀족 중 후작은 총 7명이었다. 이 중 왕족 및 왕가의 인척이 아닌 이로는 박영효가 유일했으나 그 역시 철종의 딸인 영혜옹주와 결혼한 관계로 결론적으로 보면 왕가쪽 사람이다.
한일 병합 이후 1910년의 조선귀족령(황실령 제14호)에 의해 화족에 준하는 조선귀족 제도가 마련되었다. 조선귀족에게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오작이 존재했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공작에 서임된 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조선귀족의 실질적인 최상위 작위는 후작이었다. 조선귀족의 작위는 화족에서의 동등한 작위와 대등한 입장에 있었지만, 귀족원 의원이 될 특권이 없다는 점이 화족과 달랐다.
조선귀족의 작위는 가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일 병합에서의 훈공 등에 대해 주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훈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대신급의 정치가나 군인이었던 자뿐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최상위 귀족 계급이었던 양반 출신으로 채워졌다.
조선귀족의 작위에 서임된 자는 전부 76명이며, 그 중 후작에 서임된 것은 다음 6명이다. 흥선대원군의 조카로 궁내부대신이나 육군 부장, 한성은행 행장 등을 역임한 이재완, 주일 대사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이재각, 중추원 의관이었던 이해창, 이왕가의 연지(連枝)로 시강원 시종관을 지낸 최연소의 이해승, 순종 비의 부친으로 시강원 시종관, 영친왕부 총변, 육군 부장을 역임한 윤택영, 그리고 박영효이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박영효이다. 그는 혈통이 좋고 아내가 25대 국왕 철종의 딸이라는 점으로 정치의 중추에 들어가, 김옥균과 함께 "개화파"로서 일본을 본뜬 조선 근대화를 추진했으며, 김홍집 내각이나 이완용 내각 등 친일 정권의 내부 대신이나 궁내 대신을 지냈다. 병합 후에도 조선귀족회 회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칙선 의원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명해졌다. 또한 한일 병합 당시의 한국 총리인 이완용은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했다.
이들 중 이완용, 박영효, 윤택영 등은 일제에 적극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받은 것이기에, 민족 반역자로 간주되어 현재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의 친일 행적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에게 부여된 후작 작위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고 비판한다.
3. 1. 1. 대한제국
고려 때의 후작은 오등작 중 두번째 작위로, 천자의 종실 제후는 부여후, 조선후와 같이 주로 국명과 함께 oo후로, 이성제군은 낙랑군개국후(김부식), 천수현개국후(강감찬)와 같이 지명과 함께 oo군후, oo현후 등으로 봉해졌다. 이 후 몽골 간섭기에 황제국 제도가 격하되어 봉작제가 폐지되었고 후작 역시 사라졌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조 이성계의 부마 심종이 청원후(靑原侯)에 봉해지는 등 종친과 부마를 후작에 봉하기도 하였으나[19] 태종 때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종친과 부마(왕의 사위), 조선의 부원군 중에서도 국구(왕의 장인)가 후작에 해당된다. 한일병합 이후 일제가 내린 조선귀족 중 후작은 총 7명이었다. 이 중 왕족 및 왕가의 인척이 아닌 이로는 박영효가 유일했으나 그 역시 철종의 딸인 영혜옹주와 결혼한 관계로 결론적으로 보면 왕가쪽 사람이다.
3. 1. 2. 일제강점기
한일병합 이후 일제가 내린 조선귀족 중 후작은 총 7명이었다. 이 중 왕족 및 왕가의 인척이 아닌 이로는 박영효가 유일했으나 그 역시 철종의 딸인 영혜옹주와 결혼한 관계로 결론적으로 보면 왕가쪽 사람이다.[19]
한일 병합 이후 1910년의 조선귀족령(황실령 제14호)에 의해 화족에 준하는 조선귀족 제도가 마련되었다. 조선귀족에게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오작이 존재했다. 그러나 조선귀족의 공작에 서임된 자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조선귀족의 실질적인 최상위 작위는 후작이었다. 조선귀족의 작위는 화족에서의 동등한 작위와 대등한 입장에 있었지만, 귀족원 의원이 될 특권이 없다는 점이 화족과 달랐다.
조선귀족의 작위는 가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일 병합에서의 훈공 등에 대해 주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훈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대신급의 정치가나 군인이었던 자뿐이었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최상위 귀족 계급이었던 양반 출신으로 채워졌다.
조선귀족의 작위에 서임된 자는 전부 76명이며, 그 중 후작에 서임된 것은 다음 6명이다. 흥선대원군의 조카로 궁내부대신이나 육군 부장, 한성은행 행장 등을 역임한 이재완, 주일 대사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역임한 이재각, 중추원 의관이었던 이해창, 이왕가의 연지(連枝)로 시강원 시종관을 지낸 최연소의 이해승, 순종 비의 부친으로 시강원 시종관, 영친왕부 총변, 육군 부장을 역임한 윤택영, 그리고 박영효이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박영효이다. 그는 혈통이 좋고 아내가 25대 국왕 철종의 딸이라는 점으로 정치의 중추에 들어가, 김옥균과 함께 "개화파"로서 일본을 본뜬 조선 근대화를 추진했으며, 김홍집 내각이나 이완용 내각 등 친일 정권의 내부 대신이나 궁내 대신을 지냈다. 병합 후에도 조선귀족회 회장,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귀족원 칙선 의원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유명해졌다. 또한 한일 병합 당시의 한국 총리인 이완용은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했다.
3. 2. 중국
중국에서의 후작 작위는 동주 시대부터 존재했다.[7] 건국 공신인 여상이 봉작된 제와 주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분봉받은 노(주공은 공의 작위를 받았으나, 그 후손은 후의 작위를 받았다) 등이 후작 작위를 갖고 있었다. 주 왕실과 같은 성씨인 정나라를 제외하고는 동성 제후만이 후작에 봉해질 수 있었다. 제후가 아닌 경우, 주나라 왕실에서 경사로 일하는 인물만이 후작위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직책이었다.[7]
『예기』에는 "왕자의 제록작(王者之制祿爵), 공후백자남 범오등(公侯伯子男 凡五等)"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후(侯)"는 다섯 개의 작위 중 두 번째에 위치한다。 반면에 『맹자』 만장하에는 "천자지경(天子之卿), 수지시후(受地視侯), 대부수지시백(大夫受地視伯), 원사수지시자남(元士受地視子男)"이라고 하여, 천자를 작위의 으뜸으로 칭하고, 후는 영지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예기』, 『맹자』와 함께 후는 공과 함께 백 리 사방의 영지를 갖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춘추공양전』에는 "천자는 삼공을 공이라 칭하고, 왕자지후는 공이라 칭하고, 그 외의 대국은 후라 칭하고, 소국은 백, 자, 남이라 칭한다"는 삼등 작위제가 기술되어 있다。 금문 사료가 검토되면서 푸치니안、궈모뤄、양슈다와 같은 연구자들은 오등 작위 제도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후세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 보았다。 왕스민이 금문 사료를 검토했을 때 공, 후, 백에는 일정한 규칙이 존재했지만, 자와 남에 관해서는 실태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전한 시대에는 왕작의 도입으로 거의 유명무실해졌으며, 후한 시대에 후작 지위가 확대되어 현후, 향후, 정후로 구분되었고, 후기에 들어서 허봉이 되었다. 위의 함희 원년(264년), 작위 제도가 개혁되어 후의 작위가 부활했다. "공후백자남"의 작위는 열후와 정후 위에 위치하며, 제후왕의 아래 지위가 된다。 식읍은 대국이면 천육백 호, 칠십 리 사방의 토지, 다음 나라는 천사백 호, 육십오 리 사방의 토지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서진에서도 작위 제도는 존속했고,혜제 이후에는 공, 후의 남발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동진에서는 혜제 시대의 작위를 강등하기도 했다。
함희(咸熙) 원년의 오등작제 발족 당시, 삼공이었던 왕상, 정충, 그 외의 중신 가충, 석포, 위관, 배수, 하증 등이 후작이 되었으나, 진 왕조 성립 후에는 모두 공으로 진급하였다。 또한 당시 진왕 사마소의 동생이었던 사마준도 '후'의 작위를 받았으나, 진 왕조 성립 후에는 제후왕이 되었다。
태강의 역의 논공행상으로, 두예, 왕준, 당빈, 왕융과 같은 군사 사령관이나 오나라 토벌을 권유한 장화가 후작의 작위를 받았다[18]。 이들 전역의 공로자에게는 규정을 초과한 식읍도 주어졌다. 장화에게는 1만 호, 두예에게는 9천 6백 호의 식읍이 내려졌다。 또한 양호는 무제 수선 시에 자작에서 후작으로 진급하였다。 그 외에 서진 멸망 당시의 태위 왕연도 후작(무릉후)이었다。
남북조 시대에서도 진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서작이 행해졌다. 수나라에서는 국왕, 군왕, 국공, 현공, 후, 백, 자, 남의 작위가 설치되었고, 당나라에서는 왕, 개국국공, 개국군공, 개국현공, 개국후, 개국백, 개국자, 개국남의 작위가 설치되었다.[7] 이후 여진족이 건국했던 청나라가 신해혁명으로 1912년에 몰락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봉건 제도하의 5등작 중에서 제2위의 작위명이다.
3. 3. 일본
일본에서 후작은 메이지 시대에 도입된 화족 제도에서 공작 다음가는 지위였다.[9] 청화가, 도쿠가와 고산케, 15만 석 이상의 다이묘, 류큐 왕가 출신, 그리고 국가에 공을 세운 자들(사이고 주도, 이노우에 가오루, 노즈 미치츠라, 고무라 주타로, 사사키 다카유키, 오쿠마 시게노부, 도고 헤이하치로 등)에게 수여되었다.[7] 다른 작위들과 마찬가지로,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인해 화족 제도가 폐지되면서 후작 작위도 함께 사라졌다.
1884년(메이지 17년) 5월경 훈공국 총재 야나기하라 마에미츠 등에 의해 각 가문의 서작 기준이 되는 서작 내규가 정해졌고, 기존의 화족(구 화족)에 더해 훈공자나 신적 강하한 황족도 서작 대상에 포함되었다. 같은 해 7월 7일에 발효된 화족령에 의해 오작제에 기초한 화족 제도의 운용이 시작되었다.
후작은 공작 다음으로 두 번째이며, 서작 내규에서는 후작의 서작 기준에 대해 "구 세이카 가 도쿠가와 구 삼가 구 다이한 지사 즉 현미 15만 석 이상 구 류큐 번왕 국가에 훈공이 있는 자"라고 규정했다. 후작가의 수는 1884년 시점에서는 24가(화족가의 총수 509가), 1895년에는 34가(동 643가), 1916년 시 38가(동 933가), 1928년 시 40가(954가), 1947년 시 38가(889가)였다.
1889년(메이지 22년) 귀족원령에 의해 귀족원 의원의 종류로서 화족 의원이 설치되었고, 공작, 후작은 만 25세(다이쇼 14년 이후는 만 30세)에 달하면 자동으로 종신으로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이에 반해 백작 이하는 동작자 간의 연기·기명 투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만이 임기 7년의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또한 공작, 후작 의원이 무급이었던 반면, 백작 이하의 의원은 유급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공작, 후작 의원은 백작 이하의 의원들만큼 귀족원 활동에 열심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고, 본회의 출석률조차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현역 군인인 공작, 후작 의원은 황족 의원과 마찬가지로 군인의 정치 불간여의 원칙에 따라 귀족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구로다 나가나리 후작, 사사키 유키타다 후작, 호소카와 모리타츠 후작 등 대표적인 귀족원 정치가로서 활약한 후작도 있다.
역대 귀족원 의장은 이토 히로부미 백작과 마츠다이라 요리히사 백작을 제외하고 전원이 공작, 후작이었으며, 귀족원 부의장도 공작, 후작이 많았다. 귀족원 내에는 작위별로 회파가 형성되었지만, 공작, 후작은 오랫동안 각 파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1927년(쇼와 2년)에는 고노에 후미마로 공작의 주도로 "화요회"라는 공작, 후작 의원에 의한 원내 회파가 형성되었다.
1947년(쇼와 22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제14조에서 "화족 기타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됨에 따라 후작위를 포함한 화족 제도는 폐지되었다.
4. 서양
### 프랑스
중세 초기 대봉건영주의 권력이 왕권을 침식하면서 후작의 지위는 사실상 대공작령(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후에 소규모 봉토가 병합되면서 강력한 영주권을 지닌 소수의 백작들이 후작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로는 공작보다 낮은 후작의 지위는 백작과 작위의 구분이 모호해져 때로 백작이 더 높이 평가되거나 백작의 봉토가 후작의 봉토보다 클 때도 있었으나, 왕실의 특권을 받은 후작은 백작보다 우월했다.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17, 18세기에는 작위를 사칭하는 일이 빈번해져 후작의 지위는 오히려 불명예를 야기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1세가 후작위를 폐지했으나 루이 18세가 복위 후에 이를 부활시키고 공작과 백작 사이의 지위를 부여했다.
### 영국
1385년에 로버트 드 비어가 더블린 후작(Marquess of Dublin)으로 서임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12] 영국에서 후작은 공작 아래, 백작 위의 지위이다. 후작 부인은 '''후작 부인'''(Marchioness영어)으로 불린다.
### 현존하는 영국의 후작
### 스페인
스페인에서 후작(Marqués/Marquesa) 작위는 여전히 존재하며, 142개가 스페인 그란데이다.[14] 일반적으로 후작(marqués)은 "가장 훌륭하신 군주"(Ilustrísimo Señor)로, 그란데인 경우 "가장 훌륭하신 군주"(Excelentísimo Señor)로 불린다.[14] 예를 들어 카르피오 후작은 스페인 그란데이다.
국왕의 칭호인 프린시페(Príncipe, 왕자)를 제외하면, 스페인 귀족 계급은 공작(Duque), 후작(Marqués), 백작(Conde), 자작(Vizconde), 남작(Barón), 령(Señor) 순이며, 후작은 공작 다음이다.[14] 후작위에는 그란데 격식이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란데 격식이 있는 작위 보유자는 Excelentísimo Señor (남성) 또는 Excelentísima Señora (여성), 없는 경우는 Ilustrísimo Señor (남성) 또는 Ilustrísima Señora (여성) 경칭으로 불린다.[14]
백작 이상 귀족의 장남은 다른 칭호가 없으면 부모 칭호에서 유래하는 지명의 자작위를 작위 계승까지 칭할 수 있다.[14] 귀족 칭호 포기는 가능하나, 다른 상속 자격자 권리를 해칠 수 없고, 직접적 상속인 외 상속자 지명은 불가하다.[14] 칭호 보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1년 내 법무성에 계승을 청원해야 하며, 2년 내 미청원 시 수작자 사망 장소 주 정부가 정부 공보에 발표 후 다른 승계인에게 계승 기회가 주어진다.[14] 작위 계승에는 소정의 요금이 부과된다.[14]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전신인 카스티야 왕국, 아라곤 연합 왕국, 나바라 왕국에 각각 작위 귀족 제도가 있었다. 17세기 카스티야 귀족 작위는 공작, 후작, 백작으로 한정되었고, 이 세 작위 차기 후보자가 드물게 자작을 사용했다. 1520년까지 카스티야 작위 귀족은 35명뿐이었으나, 펠리페 3세 시대 이후 급증했다.
1931년 혁명으로 왕위가 폐지되어 스페인 제2공화국이 되었을 때 귀족 제도가 폐지되었지만,[15] 1948년 총통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귀족 제도를 부활시켰고,[14][16] 국왕에 의한 수작과 동일한 규칙 하에 프랑코가 수작을 행했다.[14] 왕정 복고 후에는 다시 국왕이 수작을 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스페인 후작위는 1397개이며, 이 중 153개는 그란데 격식을 갖춘 후작위이다.[17] 유명한 후작위로는 에르난 코르테스 자손의 바예 데 오아하카 후작, 프란시스코 프랑코 자손의 비야베르데 후작, 아가타 루이스 데 라 프라다/Ágatha Ruiz de la Pradaes의 카스텔도스리우스 후작/Marquesado de Castelldosríuses, 카예타나 알바레스 데 톨레도/Cayetana Álvarez de Toledoes의 카사 푸에르테 후작/Marquesado de Casa Fuertees 등이 있다. 폐지된 후작위지만 화가 살바도르 달리도 달리 데 푸블 후작/Marquesado de Dalí de Púboles에 서위되었다.
카를리스타 왕위 요구자에 의해 창설된 171개 칭호 중에도 41개 후작위가 존재했다.[14]
### 벨기에
벨기에의 후작 칭호는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 귀족 가문 내 후작에 대해서는 벨기에 귀족#후작 문서를 참고하고, 후작 가문 목록은 벨기에 귀족 가문 목록#후작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4. 1. 프랑스
중세 초기 대봉건영주의 권력이 왕권을 침식하면서 후작의 지위는 사실상 대공작령(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후에 소규모 봉토가 병합되면서 강력한 영주권을 지닌 소수의 백작들이 후작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로는 공작보다 낮은 후작의 지위는 백작과 작위의 구분이 모호해져 때로 백작이 더 높이 평가되거나 백작의 봉토가 후작의 봉토보다 클 때도 있었으나, 왕실의 특권을 받은 후작은 백작보다 우월했다.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17, 18세기에는 작위를 사칭하는 일이 빈번해져 후작의 지위는 오히려 불명예를 야기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 1세가 후작위를 폐지했으나 루이 18세가 복위 후에 이를 부활시키고 공작과 백작 사이의 지위를 부여했다.4. 2. 영국
1385년에 로버트 드 비어가 더블린 후작(Marquess of Dublin)으로 서임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12] 영국에서 후작은 공작 아래, 백작 위의 지위이다. 후작 부인은 '''후작 부인'''(Marchioness영어)으로 불린다.
4. 2. 1. 현존하는 영국의 후작
(작위의 창설 연도와 분류)가문
(1551년 창설, 잉글랜드 귀족)
폴렛 가
나이젤 폴렛
(1941 - )
(1599년 창설, 스코틀랜드 귀족)
(1944 - )
(1682년 창설, 스코틀랜드 귀족)
더글러스 가
(1929 - )
(1694년 창설, 스코틀랜드 귀족)
헤이 가
데이비드 헤이
(1947 - )
(1701년 창설, 스코틀랜드 귀족)
카 가
(1945 - )
(1784년 창설, 그레이트브리튼 귀족)
페티-피츠모리스 가
(1941 - )
(1787년 창설, 그레이트브리튼 귀족)
타운젠드 가
찰스 타운젠드
(1945 - )
(1789년 창설, 그레이트브리튼 귀족)
가스코인-세실 가
로버트 가스코인-세실
(1946 - )
(1789년 창설, 그레이트브리튼 귀족)
신 가
(1974 - )
(1793년 창설, 그레이트브리튼 귀족)
시모어 가
(1958 - )
(1796년 창설, 그레이트브리튼 귀족)
크라이턴-스튜어트 가
존 크라이턴-스튜어트
(1989 - )
(1789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베레스퍼드 가
헨리 베레스퍼드
(1958 - )
(1789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힐 가
니콜라스 힐
(1959 - )
(1791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치체스터 가
(1952 - )
(1800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테일러 가
(1959 - )
(1800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브라운 가
(1964 - )
(1800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토테넘 가
찰스 토테넘
(1943 - )
(1816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베인-템페스트-스튜어트 가
프레데릭 베인-템페스트-스튜어트
(1972 - )
(1816년 창설, 아일랜드 귀족)
커닝햄 가
(1951 - )
(1801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세실 가
(1935 - )
(1812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컴턴 가
스펜서 컴턴
(1946 - )
(1812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프랫 가
데이비드 프랫
(1930 - )
(1815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파젯 가
(1950 - )
(1815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촘리 가
데이비드 촘리
(1960 - )
(1821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브루데넬-브루스 가
(1926 - )
(1826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허비 가
(1979 - )
(1831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케네디 가
데이비드 케네디
(1958 - )
(1838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핍스 가
(1954 - )
(1876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네빌 가
(1955 - )
(1892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다르 가
(1937 - )
(1902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호프 가
(1946 - )
(1916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조지 고든
(1983 - )
(1917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마운트배튼 가
조지 마운트배튼
(1961 - )
(1926년 창설, 연합 왕국 귀족)
아이작스 가
(1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