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18세기부터 제기되었다. 이마누엘 칸트와 토머스 페인 등의 저술에서 기본 원리가 제시되었으며, 20세기 후반 범죄학자 딘 밥스트의 통계 연구를 통해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와 전쟁의 정의, 민주적 규범과 정치 구조,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차이 등을 설명하며, 다양한 이론적 설명과 함께 비판과 반론에 직면해 왔다. 비판으로는 통계적 유의성 문제, 예외 사례, 평화가 민주주의보다 먼저라는 주장, 제3의 요인,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전쟁, 정의 및 방법론에 대한 비판 등이 있다. 현실주의적 설명, 핵 억지력, 경제적 요인 등과도 연관되며, 학문적 의의와 영향력을 지닌다. 한국의 관점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평화 - 휴전
휴전은 전쟁 당사국 간 전투 중단을 위한 법적 합의로,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구적이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의 국제적 승인을 거치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 평화 - 정전 (군사)
정전은 전쟁이나 무력 분쟁에서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합의로,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이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재전쟁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 정치학 이론 - 경제고통지수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으로 계산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지표이며, 직관적인 이해를 돕지만 경제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변형된 지표들이 존재하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 정치학 이론 - 놀란 차트
놀란 차트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기준으로 정치적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도표로, 자유지상주의, 좌파, 우파, 국가주의, 중도주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되어 정치적 입장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분리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있다. - 민주주의 - V-Dem 민주주의 지수
V-Dem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지표로, 선거, 자유, 참여, 숙의, 평등 민주주의 등 다섯 가지 핵심 지수를 포함하여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한다. - 민주주의 - 시민
시민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유래하여 국민 국가의 구성원, 참정권과의 관계, 세계 시민주의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2. 역사
민주평화론의 기원은 18세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와 정치 이론가 토머스 페인의 저술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까지 이 이론은 엄밀하게 또는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1]
칸트는 1795년 저서 영구 평화론에서 입헌 공화국이 영구 평화의 필수 조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위 외에는 참전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국가가 공화제가 된다면 침략이 없어지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토머스 페인은 칸트보다 앞서 1776년 저서 상식에서 "유럽의 공화국은 모두, 그리고 아마도 항상 평화롭다"라고 주장하며 공화국의 평화로운 본성을 강조했다. 그는 군주가 명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반면, 공화국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18]
프랑스 역사학자이자 사회 과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1835~1840)에서 민주 국가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허버트 스펜서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관계를 주장했다.[1]
범죄학자 딘 밥스트는 이 주제에 대한 최초의 통계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의 논문은 1964년 ''위스콘신 사회학자''에 게재되었고,[19] 1972년에는 ''산업 연구''에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이 게재되었으나,[20]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멜빈 스몰과 J. 데이비드 싱어는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 국가 간의 전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부인했다. 이 논문은 ''예루살렘 국제 관계 저널''에 게재되어 학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21] 마이클 W. 도일의 1983년 논문은 이 이론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3. 민주주의와 전쟁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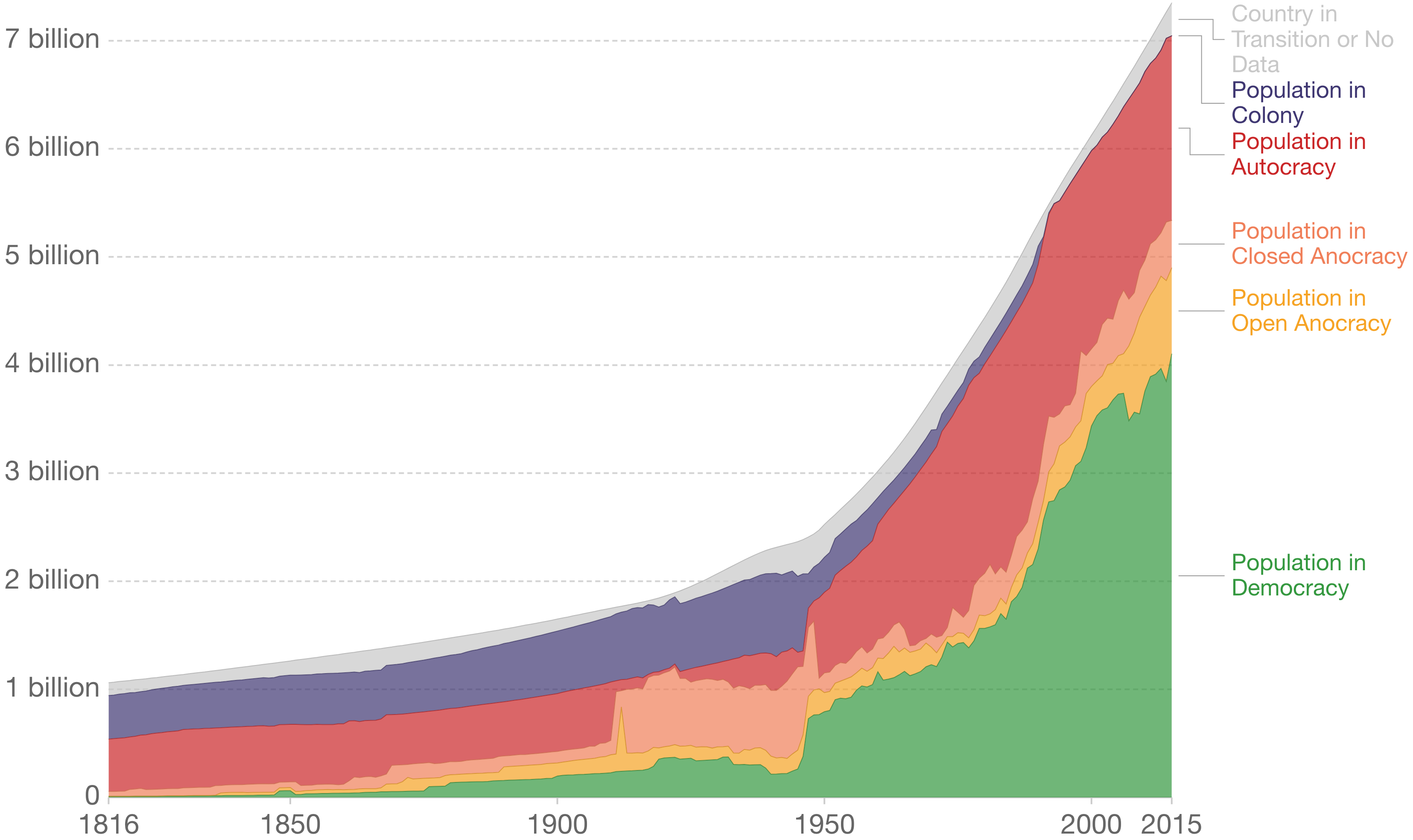
민주 평화론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와 "평화"(또는 "전쟁")를 정의해야 한다.
민주 국가는 보통 선거(남녀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는 제도), 다당제(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제도), 언론의 자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마이클 도일은 "200년 동안 민주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대에 따라 민주 국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9][20]
민주주의와 전쟁의 정의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또한, 근대 식민지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보다 국력이 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침략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민주적 평화론은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3. 1. 민주주의의 정의
민주평화론 연구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이는 연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1. 야당이 여당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2. 성인 인구의 최소 10%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3. 의회가 행정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2]
1. 시장 또는 사유 재산 경제 체제
2. 내부적으로 주권을 가진 정책
3. 사법적 권리를 가진 시민
4. 대의 정부 (성인 남성의 30% 이상 투표 가능, 또는 충분한 재산 획득을 통해 모든 남성이 투표권을 얻는 것이 가능해야 함)[2]
1. 성인 인구의 최소 50%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거를 통해 독립적인 정당 간 평화적이고 헌법적인 행정 권력 이양이 최소 한 번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2]
1. 권력자는 비밀 투표와 광범위한 선거권(성인 남성의 2/3 이상)을 통해 경쟁 선거에서 선출된다.
2. 언론, 종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
3. 정부가 복종하며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헌법적 틀이 존재한다.[2]
폴리티 데이터 시리즈와 같이 더 세분화된 척도를 사용하는 연구도 있다. 폴리티 데이터 시리즈는 1800년 이후 매년 각 국가에 대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두 가지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2] 이 외에도 여러 척도가 존재한다.[2]
일부 연구에서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된 민주주의 국가에만 평화 효과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한다.
마이클 도일은 "200년 동안 민주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대에 따라 민주 국가의 기준을 변동시켜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9][20]
3. 2. 전쟁의 정의
전쟁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보통 1년 동안 전투에서 1,000명 이상 사망한 군사적 분쟁을 전쟁으로 정의한다(전쟁의 상관관계 프로젝트).[2]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정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 Weart는 200명 이상의 전투 사망자)[2] 군사화된 국가 간 분쟁(MIDs)은 전쟁보다 작은 분쟁으로, 무력 시위 등을 포함한다.[2]
4. 이론적 설명
민주평화론은 1960년대까지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18세기 초 이마누엘 칸트와 토머스 페인 같은 철학자와 정치 이론가들의 저술에서 나타났다. 칸트는 1795년 에세이 《영구 평화론: 철학적 스케치》에서 이 이론을 예견했지만, 입헌 공화국만 있는 세상을 영구 평화를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로 보았다.[1] 페인은 1776년 《상식》에서 공화국은 평화를 유지하는 반면 왕들은 자만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1] 알렉시스 드 토크빌도 《미국의 민주주의》(1835~1840)에서 민주 국가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1]
이 주제에 대한 최초의 통계적 연구는 범죄학자 딘 밥스트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의 논문은 1964년 《위스콘신 사회학자》에 게재되었고,[1] 1972년에는 무역 저널 《산업 연구》에 더 대중화된 버전이 게재되었다.[1] 멜빈 스몰과 J. 데이비드 싱어는 민주 국가 간의 전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반박했다.[1] 이 논문은 《예루살렘 국제 관계 저널》에 게재되어 학문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1] 마이클 W. 도일의 1983년 논문은 이 이론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1]
Maoz와 Abdolali는 연구를 전쟁보다 덜 심각한 갈등으로 확장했다.[1] Bremer, Maoz, Russett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가 여러 혼합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1] 이는 이 이론을 사회 과학의 주류로 이끌었다.[1] 국제 관계의 현실주의 지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많은 반론을 제기했다.[1] 다른 연구자들은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하는 방식과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했다.[1]
이후 이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방법론적 분쟁이나 의심스러운 사례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1]
민주 평화론 연구는 "민주주의"와 "평화"(또는 "전쟁")를 정의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
민주주의 국가 간 평화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들이 제시되고 있다.
- 이념 대립 부재: 이념이 같은 나라끼리는 이념 대립이 없어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
- 의회주의적 협상 능력 발달: 민주 국가는 의회주의적 협상 능력이 발달해 비폭력적인 협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반면 독재 국가는 협의를 시간 끌기나 위협의 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 히틀러의 뮌헨 회담)
- 자유주의 (관용) 발달: 민주 국가는 소수파를 폭력으로 배제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악으로 인식한다.
- 정보 공개: 민주 국가는 정보 공개성이 높아 기습 공격을 하지 않아 상호 불신이 높아지는 일이 적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냉전 억제에도 효과적이다.
- 공격 측의 대의 명분 획득 어려움: 민주 국가는 민주주의를 정의로 간주하므로, 독재 국가를 공격할 때는 "독재자로부터 민중 해방"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쉽지만, 민주 국가를 공격할 때는 어렵다.
- 역사 단계로서 전쟁 극복: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민주 국가를 역사(국가 흥망사)가 끝난 세계, 즉 탈역사 세계라고 칭하며, 민주 국가는 전쟁을 극복했다고 보았다. 대량 살상 무기가 발달한 현대에 전쟁은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며 인도주의적으로 야만적인 행위이다. 선진국 간에는 전쟁이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유효하지 않으며,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전쟁 원인은 경제적 이해 관계 충돌이 아니라 기개, 우월감, 차별 의식(광신적인 종교 원리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의 충돌로 발생하며, 민주주의의 평등주의가 전쟁 억제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4. 1. 민주적 규범
자유 민주주의 문화는 지도자들이 협상과 타협에 익숙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3] 국내 경쟁자와의 비폭력적인 타협이라는 정치 문화를 통해 경력을 쌓아온 정책 결정자들은, 폭력적인 강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전제 군주와 달리 해외에서도 비폭력적인 방법을 선호할 것이다.브루스 러셋은 민주주의 문화가 지도자들의 갈등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19세기 말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회 규범이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이 규범은 민주주의 문화와 정도가 커지고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강화되었다.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교 파트너들은 한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냉전 시대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동맹 역시 이 규범을 강화했다.[2]
인권 존중 의식은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 특히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꺼리게 만든다. 민주주의 국가에 의한 식민주의 쇠퇴 역시 비유럽인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무소는 시장 지향적 발전이 민주주의와 평화를 모두 설명하는 규범과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덜 발전된 국가에서 개인은 종종 집단 내 규범과 신념에 순응하고 집단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한다. 반면, 시장 지향적 선진국처럼 시장에서 일자리가 풍부하면 개인은 계약을 동등하게 시행하는 강력한 국가에 의존한다. 이때 집단 지도자가 아닌 국가 법을 준수하는 인지적 루틴이 생겨나고, 계약처럼 개인 간 차이를 용인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 민주주의 유권자는 공정한 '자유주의적' 정부만을 받아들이고, 지도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확보하며 무력으로 그러한 접근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데 이익을 추구하도록 제약한다. 결과적으로 시장 민주주의는 무력 정치보다 국제법의 우위와 예측 가능성, 폐쇄적 무역과 제국주의적 선호보다 공정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무역에 대한 공통의 외교 정책적 이익을 공유한다. 시장 민주주의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해도 폭력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 두 국가 모두, 심지어 더 강한 국가조차도 권력 정치보다 법의 우위에 더 큰 장기적 이익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제시카 L.P. 위크스(Jessica L.P. Weeks)와 마이클 톰즈의 2013년 연구는 설문 조사 실험을 통해 대중이 동맹 민주주의 국가와 관련된 경우 전쟁 지지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4. 2. 민주적 정치 구조
민주주의는 전쟁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2] 민주주의 국가는 투명성, 연속성, 약속 이행 인센티브, 헌법적 통치 등 "계약적 이점"을 갖는다.여러 연구에서 자유주의 지도자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의 동의 없이 전쟁을 위해 국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제도적 제약에 직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제약은 다른 국가에 쉽게 드러나고 지도자가 조작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무력 사용에 대한 혐오감을 다른 국가에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신호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하지만, 비민주주의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
게임 이론에 기반한 설명은 대중의 참여와 공개적인 토론이 다른 국가에 민주주의 국가의 의도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민주주의 지도자의 의도, 양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속이 지켜질지 등을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 중 적어도 한 곳이 비민주주의 국가인 경우 불신과 양보에 대한 거부가 있을 것이다.
민주 평화론에 대한 주요한 합리적 선택 논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보다 더 큰 관중 비용(audience costs)을 지니고 있어, 국가 간 분쟁에서 의도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알렉산더 B. 다우네스(Alexander B. Downes)와 토드 S. 세크서(Todd S. Sechser)의 연구는 기존 데이터 세트가 민주주의 국가가 더 효과적인 위협을 가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4. 3. 민주주의 차이
민주 평화는 사실상 유사한 국가 간의 평화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독재적 평화 효과) 정치적 유사성이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이를 더욱 강화한다.[4]폴리티 데이터 시리즈와 같이 국가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분류하는 다양한 척도가 존재한다. 전쟁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보통 1년 동안 전투에서 1,000명 이상 사망한 군사적 분쟁을 전쟁으로 정의한다. 군사화된 국가 간 분쟁(MIDs)은 전쟁보다 작은 분쟁으로, 무력 시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7년 연구 검토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를 유발하며, 민주주의와 평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허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고 주장한다. 개인 숭배적 독재와 군사 독재는 일당제 국가에 비해 분쟁을 시작하기 쉬울 수 있지만, 다른 시작자를 가진 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더 높다.
일반적인 비판은 민주주의 국가가 더 평화롭다는 증거가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한다"는 주장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서로 평화로운 이유는 민주주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점수가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독재적 평화" 효과에서 비롯되었다.
정치적 유사성과 민주 평화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 정치적 유사성과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민주 평화는 통계적 인공물이라는 견해.
- 정치적 유사성은 평화적 효과를 가지지만 민주주의가 이를 강화한다는 견해.
- 전반적인 정치적 유사성은 민주주의-독재 척도의 극단을 제외하고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견해 (민주 평화와 독재 평화가 별도로 존재).
- 정치적 유사성은 거의 효과가 없으며 독재 평화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견해.
상호작용적 민주 평화 모델은 V-Dem 민주주의 지수에서 입증된 민주적 유사성과 전통적인 민주 평화 이론 모델을 결합한 것이다.[4]
민주주의 국가 간 평화가 유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5. 비판 및 반론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및 반론은 다양하며, 크게 통계적 유의성 문제, 예외 사례, 평화와 민주주의의 선후 관계, 제3의 요인,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전쟁, 정의 및 방법론, 은밀한 작전 및 대리전, 정보 조작, 쿠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더 평화롭다는 증거는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론은 "''공동''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한다"는 주장만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이다.[1]
이러한 현상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평화로운 이유가 민주주의 점수가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독재적 평화" 효과, 즉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이 가설은 민주 평화가 유사한 국가의 하위 집합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라고 주장한다.
이 비판에 대한 가능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 유사성과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민주 평화는 통계적 인공물이다. (헨더슨)
# 정치적 유사성은 평화적 효과를 가지지만 민주주의가 이를 강화한다. (워너)
# 전반적인 정치적 유사성은 민주주의-독재 척도의 극단을 제외하고 거의 효과가 없다. 민주 평화와 독재 평화는 별도로 존재하며, 전자가 더 강하고 다른 설명을 가질 수 있다. (베넷, 킨셀라)
# 정치적 유사성은 거의 효과가 없으며 독재 평화에 대한 증거가 없다. (페테르센, 레이)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은 논리적으로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1] 이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나 국제적 분쟁(MID)에는 적용되지만,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 내의 적은 체계적 폭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평화론 비판론자들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악당", "실패한", "사악한" 비자유주의 국가들과 자주 분쟁을 벌인다고 지적한다.[5]
일부 학자들은 경제적, 안보적 우려와 같은 객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정권 유형을 지속적으로 재해석한다고 비판한다.[1]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분쟁을 사후적으로 비전쟁으로, 또는 정치 체제를 비민주주의로 재분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쟁적인 선거에서 나와야 한다는 요구는 제한적인 정의일 수 있다.
사용된 데이터 세트, 특히 전쟁의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거의 정의되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경우가 없으며,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많은 연구에서 반박되었으며, 여러 일탈 사례를 설명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홍보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
민주 평화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의 전장 사망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분쟁을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덜 심각한 분쟁에서도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헤르만과 케글리 2세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개입이 예상보다 자주 발생하며,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다른 자유 국가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개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
5. 1. 통계적 유의성 문제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2]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아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데이터 표본이 작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Gowa는 1939년 이전에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너무 적어 민주 평화에 대한 증거가 미미하다고 보았다. Gowa의 통계 사용은 비판받았으며, 다른 여러 연구와 검토에서 다른 결과나 상반된 결과를 발견했다.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전쟁에 대한 다소 제한적인 정의를 사용했을 때, 1816년부터 1992년까지 공동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었다. 국가 간의 전쟁이 민주주의적 성격에 관계없이 순전히 무작위로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민주주의 국가 간의 예상 충돌 횟수는 약 10회 정도이다. 따라서 증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미래에 소수의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이 그러한 증거를 상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한다.[2]
5. 2. 예외 사례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2] 이러한 사례들은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2]- 1812년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은 모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려웠다. 남녀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미국 남북 전쟁: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발생한 내전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 파쇼다 사건: 프랑스와 영국 간의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지만, 외교적으로 해결되었다.
- 에콰도르-페루 분쟁, 대구 전쟁: 양측 모두 큰 인명 피해 없이 분쟁이 해결되었다.
- 미국-스페인 전쟁: 당시 스페인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 카르길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지전이었지만, 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정규군끼리의 교전은 없었다는 반론이 있다.[2]
- 프랑스-태국 전쟁: 1940년에 발생한 전쟁으로, 당시 프랑스는 비시 프랑스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 제2차 세계 대전 중 핀란드와 영국의 관계: 계속전쟁에서 핀란드는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었지만, 영국과의 직접적인 대규모 교전은 거의 없었다. 영국은 핀란드에 대해 소규모 군사 작전을 몇 차례 수행했는데, 이는 핀란드와 실제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소련과의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2]
-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1974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터키의 군사 개입으로 키프로스가 분단되었다.
- 파키샤 전쟁: 에콰도르와 페루 간의 국경 분쟁으로, 양국 군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다.
- 6일 전쟁 당시 레바논 공군의 개입: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에서 레바논 공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2]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당시 국가들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았거나,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도-파키스탄 전쟁의 경우, 독립 직후의 혼란기였거나 군사 정권 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군사 정권 하에 있었다. 코소보 공습의 경우, 정규군 사망자가 1000명 이하로,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보다 국력이 약한 국가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5. 3. 평화가 민주주의보다 먼저
영토 평화 이론은 평화가 민주주의보다 먼저이며, 국경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민주주의 발전이 어렵다고 주장한다.[4]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평화가 거의 항상 민주주의보다 먼저 나타나며, 모든 국경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는 국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4] 즉, 평화가 민주주의를 유발한다는 강력한 증거는 존재하지만,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한다는 증거는 미약하다.[4]평화가 민주주의를 유발한다는 가설은 심리학적, 문화적 이론으로 뒷받침된다. 크리스찬 웰젤의 인간 권한 부여 이론에 따르면, 실존적 안보는 해방적 문화 가치와 민주적 정치 조직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다.[5] 이는 진화 심리학에 기반한 왕권 이론에서도 나타난다.
영토 평화 이론은 이웃 국가와 분쟁 중인 국가가 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어려운지 설명한다. 민주 평화 이론은 이웃하지 않은 국가 간의 평화나 이미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관계에 더 적합하다.[6]
5. 4. 제3의 요인
민주주의와 평화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제도, 상업, 상호 의존성, 동맹, 미국의 세계 지배력, 정치적 안정 등이 있다.[3]이러한 이론들은 다른 설명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5. 5. 비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전쟁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들과 자주 분쟁을 벌인다는 점이다.[5] 여러 연구에서 비민주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포함할 경우,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보다 전쟁을 덜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5. 6. 정의, 방법론, 데이터 비판
민주평화론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와 "평화"(또는 "전쟁")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민주주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연구 결과에 차이를 가져온다.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스몰과 싱어는 민주주의를 (1) 야당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정기적인 선거, (2) 성인 인구의 최소 10% 투표 가능, (3) 의회가 행정부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갖는 국가로 정의한다.[19]
- 도일은 (1) 시장 또는 사유 재산 경제, (2) 내부 주권, (3) 시민의 사법적 권리, (4) 대의 정부를 "자유주의 정권"의 조건으로 제시하며, 성인 남성의 30% 투표권 또는 충분한 재산 획득을 통한 남성 투표권 획득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는 루이 필리프의 통치를 자유주의 정권으로 간주하는 등 세습 군주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2]
- 레이는 성인 인구의 최소 50% 투표 가능, 선거를 통한 독립 정당 간 평화적이고 헌법적인 행정 권력 이양 최소 1회 이상을 요구한다. 이 정의는 1800년까지의 미국, 1979년까지의 인도, 1993년까지의 일본 등 지배 정당 체제 하의 국가들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한다.[2]
- 럼멜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비밀 투표와 광범위한 선거권(성인 남성의 2/3 이상), 언론, 종교, 결사의 자유 보장, 정부가 복종하며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헌법적 틀 존재로 정의한다.[20]
위의 정의들은 국가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로 나누는 이분법적 분류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폴리티 데이터 시리즈와 같이 더 세분화된 척도를 사용한다. 폴리티 데이터 시리즈는 1800년 이후 매년 각 국가에 대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점수를 매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척도가 존재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민주 평화의 예외로 여겨지는 많은 경우들이 관련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가 매우 젊었을 때 발생했음을 관찰했다. 따라서 3년 이상 된 민주주의에 평화가 적용된다는 조건을 추가하기도 한다. 럼멜은 이것이 "민주적 절차가 수용되고 민주적 문화가 정착될" 충분한 시간이며, 다른 국가들이 해당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맨스필드와 스나이더는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민주화 국가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보다 더 호전적이라고 발견했다.
전쟁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1년 동안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군사적 분쟁으로 정의한다. 이는 전쟁의 상관관계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정의이기도 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정의를 사용한다. Weart는 전쟁을 200명 이상의 전투 사망자로 정의하며, Russett은 고대 그리스 연구에서 양측 군대의 실제 전투 교전만을 요구한다.
군사화된 국가 간 분쟁(MIDs)은 전쟁보다 작은 분쟁으로, 전투 사망자가 없는 무력 시위일 수 있다. MIDs와 전쟁을 합쳐 "군사화된 국가 간 분쟁"(MIC)이라고 한다.
통계 분석과 자유도 (통계) 문제 때문에 실제 전쟁 대신 MID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은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MIDs는 분석을 위한 더 풍부한 통계적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양자'' 평화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더 평화롭다는 ''단자'' 평화를 지지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민주평화론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는다.
- 민주주의 정의의 자의성: 민주주의 기준이 연구자마다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동되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19]
- 사후적 재분류: 일부 연구자들이 특정 분쟁을 사후적으로 비전쟁으로, 또는 정치 체제를 비민주주의로 재분류했다는 비판이 있다.
- 데이터 세트 문제: 사용된 데이터 세트, 특히 전쟁의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5. 7. 은밀한 작전 및 대리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비밀 작전을 펼치거나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들 국가가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민주평화론의 기본 전제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2]5. 8. 정보 조작
차임 카우프만은 이라크 전쟁 발발 과정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 억제 요인이 민주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며, 행정부의 수사와 상반되는 정보 수집 결과를 억누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강력한 야당과 강력한 언론이 존재하는지에 달려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5. 9. 쿠데타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를 비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침략을 받거나 침략국이 되는 경우(쿠데타 이후 급속하게) 발생하며, 때로는 쿠데타 지도자가 그러한 전쟁을 유발하려 시도한다.[2]카를 슈미트는 헌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에 대해 "주권자는 예외를 결정하는 자이다."라고 언급했다.[3] 슈미트는 내부(및 외부)의 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이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는 한, 내부 평화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위기 상황에서 국내의 적에 대해서도 결정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내부의 적을 선언하기 위한 일종의 공식을 제공한다." 모든 반대 세력은 실제 외부 적의 꼭두각시로 묘사될 것이다.[4]
6. 기타 설명
민주평화론은 1960년대까지는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그 기본 원리는 18세기 초 이마누엘 칸트와 토머스 페인 같은 철학자와 정치 이론가들의 저술에서 나타났다. 칸트는 1795년 저술한 에세이 ''영구 평화론: 철학적 스케치''에서 이 이론을 예견했지만, 입헌 공화국만 있는 세상이 영구 평화를 위한 여러 필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1] 페인은 1776년 "상식"에서 공화국은 왕의 자만심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1] 알렉시스 드 토크빌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1835~1840)에서 민주 국가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고,[1] 허버트 스펜서 역시 민주주의와 평화의 관계를 주장했다.[1]
범죄학자 딘 밥스트는 이 주제에 대한 최초의 통계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의 논문은 1964년 ''위스콘신 사회학자''에 게재되었고,[1] 1972년에는 ''산업 연구''에 좀 더 대중적인 버전이 게재되었다.[1] 멜빈 스몰과 J. 데이비드 싱어는 민주 국가 간의 전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부인했고,[1] 마이클 W. 도일의 1983년 논문은 이 이론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1]
Maoz와 Abdolali는 연구를 전쟁보다 덜 심각한 갈등으로 확장했다.[1] Bremer, Maoz, Russett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가 여러 혼합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1] 이후 국제 관계의 현실주의 지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많은 반론을 제기했고,[1] 다른 연구자들은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하는 방식과[1]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했다.[1] 이후 이 분야에서 수많은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1] 대부분의 연구는 어떤 형태의 민주적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방법론적 분쟁이나 의심스러운 사례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1]
전쟁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1년 동안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군사적 분쟁으로 정의한다.[1] 군사화된 국가 간 분쟁(MIDs)은 전쟁보다 작은 분쟁으로, 전투 사망자가 없는 무력 시위일 수 있다.[1] 통계 분석과 자유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 전쟁 대신 MIDs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 대부분의 연구는 ''양자'' 평화, 즉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더 평화롭다는 ''단자'' 평화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거의 없다.[1]
일부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처음 등장한 이후 많은 전쟁이 벌어졌지만,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이 이론의 반대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 사례가 많다고 주장한다.[2] 역사적으로 민주평화론의 문제적인 사례로는 시칠리아 원정, 1812년 전쟁, 미국 남북 전쟁, 파쇼다 사건, 에콰도르-페루 분쟁, 대구 전쟁, 미국-스페인 전쟁, 카르길 전쟁 등이 있다.[2] 2017년의 한 연구 검토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를 유발하며, 민주주의와 평화 사이의 관찰된 상관관계가 허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2]
몇몇 연구가 분쟁 시작을 조사했다. Reiter와 Stam은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고 주장하고,[2] Quackenbush와 Rudy는 Reiter와 Stam의 결과를 확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는 것을 발견했다.[2] 이후의 여러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제도를 가진 다양한 유형의 권위주의 국가가 분쟁 시작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른지 연구했다.[2] 2017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보다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다고 한다.[2]
민주주의 국가가 내부의 체계적인 폭력을 덜 겪는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민주적인 국가와 가장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 내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중간 정도의 정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2] Abadie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민주적인 국가에서 테러가 가장 적게 발생하고,[2] Harff는 집단 학살과 정치 학살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물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2] Rummel은 정권이 더 민주적일수록 대량 학살이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2]
이러한 이론들은 전통적으로 민주적 규범에 초점을 맞춘 설명과 민주적 정치 구조에 초점을 맞춘 설명으로 분류된다.[2] V-Dem 연구소(V-Dem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행정부에 대한 부처 간 제약과 시민 사회 활동 모두가 민주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지만, 직접적인 선거를 통한 책임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3]
자유 민주주의 문화는 지도자들이 협상과 타협에 익숙해지도록 만들 수 있고,[3] 인권에 대한 믿음이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전쟁을 꺼리게 만들 수 있다.[3] 브루스 러셋은 민주주의 문화가 지도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3] 한스 쾨클러는 초국가적 민주주의 문제를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개인 시민을 참여시켜 국가의 국제 문제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시키며, 민주적 규범에 따라 국제 연합 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3] 무소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모두 설명하는 규범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장 지향적 발전이라고 주장한다.[3] 브라움엘러는 갈등 해결에 대한 자유주의적 규범이 다양한데, 그 이유는 자유주의가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3] 제시카 L.P. 위크스(Jessica L.P. Weeks)와 마이클 톰즈가 2013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설문 조사 실험을 통해 대중은 동맹 민주주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3]
민주적 정치 구조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마누엘 칸트는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전쟁의 모든 재앙을 스스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고 썼다.[3] 따라서 민주주의는 전쟁에서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3] 찰스 립슨은 민주주의 국가가 (1) 더 큰 투명성, (2) 더 큰 연속성, (3)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선거적 인센티브, (4) 헌법적 통치로 인해 다자간 민주 평화를 이끄는 "계약적 이점"을 갖는다고 주장한다.[3]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 국가보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3] 젤피와 그리엔스도르프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지도자가 광범위한 이해관계의 동의 없이 전쟁을 위해 국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 제도적 제약에 직면한다고 주장했고,[3] 제프 카터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는 전쟁을 위해 동원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3] 게임 이론에 기반한 설명은 대중의 참여와 공개적인 토론이 다른 국가에 민주주의 국가의 의도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이다.[3] 콜먼은 독재와 자유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경우를 조사하여 칸트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3] 브래드 르벡과 닐 나랑은 민주주의 국가는 외교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더 크고 다양한 배우들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의사 결정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3] 선택자 이론을 사용하여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제임스 D. 모로우, 랜돌프 M. 시버슨, 알라스테어 스미스는 민주 평화가 부분적으로 민주 지도자가 큰 승리 연합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3]
민주 평화론에 대한 주요한 합리적 선택 논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보다 더 큰 관중 비용(audience costs)을 지니고 있어, 국가 간 분쟁에서 의도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알렉산더 B. 다우네스 (Alexander B. Downes)와 토드 S. 세크서 (Todd S. Sechser)의 연구는 기존 데이터 세트가 민주주의 국가가 더 효과적인 위협을 가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3] 다른 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신뢰성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과 관계와 실증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3] 제시카 L.P. 위크스(Jessica Weeks)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권위주의 정권 유형은 민주주의 국가와 유사한 관중 비용을 갖는다.[3]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관중 비용 문헌의 예상과 상반된다.[3]
일반적인 비판은, 실제로 이 이론이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더 평화롭다는 증거가 매우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3] 민주주의 점수가 유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고,[3] 이는 "독재적 평화" 효과, 즉 비민주주의 국가 또는 고도로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 간의 전쟁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여러 독립적인 관찰에서 시작되었다.[3] 민주적 규범에 대한 최근 연구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미시적 기반이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3] 세바스찬 로사토(Sebastian Rosato)는 민주 평화 이론이 몇 가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여론은 민주 국가의 대중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민주 국가의 대중이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국가의 대중보다 전쟁에 더 반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3]
평화는 다양한 제약과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 세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민주 평화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분쟁을 전쟁으로 간주하지 않고,[3]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1945년 이후 다른 국가들보다 이러한 전쟁을 덜 겪었다.[3] Hermann과 Kegley Jr.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개입이 예상되는 모델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한다.[3] Rummel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마도 이번 세기 중반이나 그 전에 전쟁과 대량 학살이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3] 공산주의의 몰락과 민주주의 국가의 증가는 총 전쟁, 국가 간 전쟁, 민족 전쟁, 혁명 전쟁, 그리고 난민과 피난민의 수의 급격하고 극적인 감소를 동반했다.[3]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연구들은 평화의 다른 가능한 원인들을 통제해왔고,[3] 일부 연구는 또한 평화에서 민주주의로의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통제했다.[3] 웨어트는 민주주의가 나타나고 사라질 때 평화로움이 빠르게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주장한다.[3] 전쟁은 이웃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3] 2020년 ''International Organization''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였다.[3]
아자르 개트의 ''인간 문명에서의 전쟁''에 따르면, 민주 사회가 다른 형태의 정부보다 더 평화로운 데 기여하는 몇 가지 관련되고 독립적인 요인이 있다.[3]
6. 1. 경제적 요인
자본주의 평화론은 경제 발전(자본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 간에는 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낮은 수준의 분쟁도 드물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와 민주주의 자체를 모두 설명하여 민주 평화론을 보완한다. 인과 관계는 제안된 변수와 개념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경제 발전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데 동의한다.[4] 따라서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 발전이 평화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무소(Mousseau)는 선진 시장 지향 경제의 계약 문화가 민주주의와 평화를 모두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주주의만으로는 민주 평화의 가능성이 낮은 원인임을 보여준다. 낮은 수준의 시장 지향적 경제 발전은 자유주의적 제도와 가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4] 헤그레(Hegre)와 수바(Souva)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했다.[4] 무소는 두 민주주의 국가 모두가 글로벌 중앙값보다 훨씬 높은 경제 발전 수준을 가질 때만 민주주의가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했다. 실제로, 연구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위 21%와 현재 민주주의 국가 중 하위 4~5%는 다른 종류의 국가보다 서로 싸울 가능성이 훨씬 높다.[4] 무소, 헤그레, 오닐은 관련된 민주주의 국가 중 적어도 하나가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보일 경우, 민주주의는 전쟁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무역을 통제할 때, 1885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 동안과 1992년 전체에 민주주의의 평화 효과가 중요할 만큼 충분히 높은 발전을 보인 민주주의 쌍의 91%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4] 이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표본 추출 때문일 수 있다. 무소의 2005년 연구는 가난한 국가들이 실제로 서로 싸울 수 있는 이웃 국가만을 관찰했다. 실제로, 1920년부터 2000년까지 덜 발전된 국가 간의 군사적 갈등의 89%가 직접 인접한 이웃 국가 간에서 발생했다.[4] 그는 그 결과가 무역으로 설명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무역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4] 실제로, 선진 민주주의와 무역 상호 의존성의 상관 관계는 0.06에 불과하다(피어슨의 ''r'' – 통계학자들은 실질적인 상관 관계가 없다고 간주한다.[4]).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모두 경제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졌다. 무소는 독일과 일본이 - 냉전 시대의 소련과 오늘날의 사우디 아라비아처럼 - 국가가 관리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시장 규범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4] 헤그레는 민주주의가 선진국과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국가에서만 시민 평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대로, 내전의 위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발전에 따라 감소한다.[4]
가르츠케(Gartzke)는 경제적 자유(무소의 시장 규범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 또는 재정적 의존성이 선진 민주 평화를 설명하며, 이러한 국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 럼멜(Rummel)은 가르츠케의 방법론을 비판하며 그의 결과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4]
앨런 데포, 존 R. 오닐, 브루스 러셋은 가르츠케와 무소의 연구에 이의를 제기했다.[4]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더 많은 무역이 더 큰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유발하고, 더 많은 정부 간 기구에 가입하면 전쟁의 위험이 감소한다. 이것은 종종 칸트의 영구 평화에 대한 초기 이론과 유사하기 때문에 칸트 평화 이론이라고 불린다. 또한 무역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맞출 때 특히 "자유주의적 평화"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자유 무역이 평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코브덴주의라고 불린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각각 개별적인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예를 들어, 상당한 양의 무역을 교환하는 국가에서는 상호 파괴적인 전쟁에 반대하는 경제적 이익 집단이 존재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4] 위드(Weede)는 자유 무역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진정 효과가 민주주의의 효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자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생성함으로써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모두 평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 위드는 또한 이 견해를 지지하는 다른 일부 저자들을 나열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역에서는 효과가 없고 민주주의에서만 효과가 나타난다.[4]
나열된 저자 중 어느 누구도 자유 무역만으로 평화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자유 무역과 민주주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여부는 예를 들어, 독재 국가에 경제 제재와 제한을 적용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실제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칸트의 세 가지 조항을 민주 평화 이론에 다시 도입한 사람은 마이클 도일이었다. 그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평화적 연합이 지난 2세기 동안 성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국가가 모두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평화로울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자유주의 국가는 약한 비자유주의 국가에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멕시코의 관계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는 국제 기구와 환대(칸트의 다른 두 조항)에 필요한 조건이며, 이 세 가지 모두가 평화를 낳기에 충분하다.[2] 다른 칸트주의자들은 세 가지 모두가 존재해야 한다는 도일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대신 세 가지 모두가 전쟁의 위험을 줄인다고 진술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지배적인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된 이익을 창출하여 잠재적으로 해로운 호전성을 억제하는 것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4]
토니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는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글로벌 자본주의의 얽힌 이익 네트워크가 개별 국가의 쇠퇴와 외부가 없고 외부의 적이 없는 글로벌 ''제국''의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그들은 "제국주의, 중간 제국주의, 반제국주의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 (...) 우리는 사소하고 내부적인 갈등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모든 제국주의 전쟁은 내전이며, 경찰 작전이다"라고 썼다.[4]
6. 2. 현실주의적 설명
현실주의자들은 민주 평화 효과가 동맹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위협으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4] 파버(Farber)와 고와(Gowa)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에 대한 증거가 1945년 이후 기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4]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1945년 이전의 영미 평화가 독일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5] 스피로(Spiro)는 민주주의 국가 간의 여러 전쟁 사례를 제시하며, 이 이론에 찬성하는 증거가 다른 저자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방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나머지 증거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동맹 국가 간의 평화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6]또한, 미국의 지배에 의해 강요된 팍스 아메리카나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7] 로사토(Rosato)는 민주적 평화에 대한 중요한 증거의 대부분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관찰되었으며, 이는 NATO와 그 위성 국가로 식별될 수 있는 광범위한 동맹 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7] 그는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 1973년 칠레 쿠데타, 아약스 작전(1953년 이란 쿠데타) 및 PB성공 작전(1954년 과테말라 쿠데타)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문제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개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개입이 미국의 "제국 평화" 유지 의지를 보여준다고 본다.[7]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동맹 관계를 통제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 간의 평화가 유의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기도 한다.[8]
6. 3. 핵 억지력
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MAD)를 초래하여 강대국 간 전쟁을 억제한다는 주장이 있다.[3]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핵 보유국 간의 분쟁은 상호확증파괴로 인해 양측 모두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되므로, 각국의 국력 평가가 무의미할 수 있다.[4]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카르길 전쟁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례로 인용되기도 하지만,[5] 이는 작고 지역적인 분쟁이었으며,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 위협이 분쟁 완화에 기여했다.[6]7. 학문적 의의 및 영향
민주평화론은 국제 관계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론이지만, 정치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3] 여러 연구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외교 관계에서도 더 화해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5]
이러한 학문적 연구 결과는 현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과 유럽 연합의 크리스 패튼, 토니 블레어 등이 민주평화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6]
하지만 민주평화론이 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으로 하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주의 십자군'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7]
8. 관련 이론
민주평화론은 1960년대까지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이마누엘 칸트, 토머스 페인 등의 저술을 통해 18세기 초에 기본 원리가 주장되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835~1840)에서 민주 국가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고,[1] 허버트 스펜서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관계를 주장했다.
범죄학자 딘 밥스트는 이 주제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처음으로 수행했다. 그의 논문은 1964년과 1972년에 발표되었으나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다.[2][3] 멜빈 스몰과 J. 데이비드 싱어는 민주 국가 간의 전쟁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부인했다.[4] 마이클 W. 도일의 1983년 논문은 이 이론을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
Maoz와 Abdolali는 연구를 전쟁보다 덜 심각한 갈등으로 확장했다.[5] Bremer, Maoz, Russett은 여러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했다.[6][7] 이에 국제 관계의 현실주의 지지자들은 많은 반론을 제기했고, 다른 연구자들은 민주주의가 평화를 유발하는 방식과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8][9]
8. 1. 공화주의적 자유주의
자유 민주주의와 공화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드물다는 민주 평화 이론의 한 갈래이다. 마이클 도일에 따르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서로 교역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공화국)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항상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자유주의는 포괄적인 이론으로서, 외교와 협력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8] 이는 인간 본성이나 무정부적인 국제 체제 때문에 국제 체제에서 갈등이 항상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주의 이론과 대조된다.[9]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의 개념은 원래 이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 평화론"(1795)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영구 평화"라는 용어는 평화가 영구적으로 확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책으로 유명해졌다. 민주 평화, 상업 평화, 제도적 평화 또한 이 책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인류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전쟁에 대한 열망을 능가할 것이라는 다소 이상적인 견해를 취한다.[10]
8. 2. 칸트적 자유주의
민주평화론의 기본 원리는 18세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와 정치 이론가 토머스 페인의 저술에서 주장되었다. 칸트는 1795년에 저술한 그의 에세이 ''영구 평화론''에서 이 이론을 예견했지만, 그는 입헌 공화국만 있는 세상이 영구 평화를 위한 여러 필수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토머스 페인은 1776년 "상식"에서 "유럽의 공화국들은 모두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썼다. 페인은 공화국이 전쟁을 하지 않을 상황에서 왕들이 자만심 때문에 전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8]칸트와 자유주의 학파는 국제 협력을 국가가 전쟁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본다. 칸트는 오직 평화만 존재하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한 세 가지 확정적 조항을 제시했다.[11]
:'''I "모든 국가의 시민 헌법은 공화국이어야 한다"'''
:'''II "만국법은 자유 국가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III "세계 시민의 법은 보편적 환대의 조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칸트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 형태의 정부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즉, "최고 권력이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12] 칸트는 시민들에게 투표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전쟁을 줄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또한 "군주의 권력을 견제"하는[13]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칸트는 국가도 언제든지 서로에게 해를 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법치가 확립되어야 하며, 국제법과 사법 기구가 없다면 무력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대신 국가는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 기구와 규칙을 개발해야 하며,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연방이 필요하다.
칸트는 "타인의 땅에 도착했을 때 적대 행위를 받지 않을 이방인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10] "이방인"이 평화로운 한, 적대 행위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참조
[1]
저널
War and the Democratic State
https://www.jstor.or[...]
1916
[2]
문서
[3]
논문
Reassessing the Democratic Peace: A Novel Test Based on the Varieties of Democracy Data
https://dx.doi.org/1[...]
[4]
저널
An interactive model of democratic peace
https://doi.org/10.1[...]
[5]
서적
Developmental Peace: Theorizing China's Approach to International Peacebuilding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4
[6]
서적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and approaches
OUP
[7]
저널
Liberalism and World Politics
https://www.jstor.or[...]
1986
[8]
웹사이트
Introducing Libe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ttps://www.e-ir.inf[...]
2018-02-18
[9]
웹사이트
Realism and Libe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https://www.e-ir.inf[...]
2011-07-02
[10]
웹사이트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https://www.mtholyok[...]
[11]
저널
Liberalism
http://www.oxfordbib[...]
[12]
웹사이트
REPUBLIC English Definition and Meaning {{!}} Lexico.com
https://www.lexico.c[...]
[13]
서적
International relations
2016
[14]
논문
Complexity Theory as a Tool for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Ethnic Conflict and Development Issues in Post-Soviet Eurasia
http://www.gmu.edu/a[...]
[15]
웹사이트
http://robertnielsen[...]
[16]
웹사이트
http://www.mendeley.[...]
[17]
서적
The Global Commonwealth of Citizens. Toward Cosmopolitan Democracy
http://press.princ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18]
서적
Causes of War
John Wiley & Sons
[19]
문서
역사의 끝
[20]
문서
남녀 보통선거제
[21]
문서
팍스 데모크라티아
[22]
저널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23]
서적
왈츠 이후
한울 아카데미
[24]
서적
The Global Commonwealth of Citizens. Toward Cosmopolitan Democracy
http://press.princ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5]
저널
Democratic Peace Theory: A Review and Evaluatio
https://www.research[...]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