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식민주의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가 지속시키는 권력 관계,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서사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이는 식민주의 이후의 체제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 식민주의 사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응을 나타낸다. 탈식민주의 연구는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정체성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고, 오리엔탈리즘, 신식민주의, 하위 주체, 혼종성 등의 개념을 통해 식민 지배의 영향과 그에 대한 저항을 탐구한다. 주요 이론가로는 프란츠 파농, 에드워드 사이드, 가야트리 스피박, 호미 바바 등이 있으며, 문학, 지역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탈식민주의는 보편적 가치 훼손, 국가 정체성 고착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신식민주의 - 워싱턴 합의
워싱턴 합의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워싱턴 D.C. 소재 국제기구들이 개발도상국 및 체제 전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제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패키지로, 적용 결과와 비판적 평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신식민주의 - 룸펜 부르주아지
룸펜 부르주아지는 마르크스주의 용어로,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며 외국의 착취를 돕는 계층을 비판적으로 묘사하며,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의 특성을 결합한다. - 탈구조주의 - 대륙 철학
대륙 철학은 20세기 중반 영미권 분석철학에 동참하지 않은 유럽 대륙의 철학 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현상학, 실존주의,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등을 포괄하며 칸트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식, 경험, 현실이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이해되는 조건들에 의해 제약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 탈구조주의 -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는 관계로, 텍스트 내에 인용, 표절, 암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다른 텍스트의 존재를 의미하며, 제라르 쥐네트는 이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표절과 혼동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포스트식민주의 - 프란츠 파농
프란츠 파농은 마르티니크 출신의 정신의학자, 혁명가, 작가로서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폭력과 해방, 정체성,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저술로 유명하며, 알제리 독립 전쟁 당시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을 지원했고, 그의 사상은 탈식민주의 이론과 흑인 해방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포스트식민주의 - 신사파타주의
신사파티스타주의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추구하는 사상으로, 자유지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사상 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급진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강조한다.
2.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지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탈식민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프란츠 파농, 에메 세제르 등은 식민지 해방 투쟁 과정에서 식민주의가 피식민 지배 민족에게 남긴 정신적, 문화적 상처와 억압을 고발하고, 새로운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후기 식민주의는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적 관점에서 탈식민화된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다.[2] 식민지배자가 식민지 주민에 대해 생성한 문화적 지식과 그 지식이 식민 지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식민지배자'와 '식민지 피지배자'라는 문화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한다.
후기 식민주의는 식민주의자들의 지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이론들을 무력화하여 하층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 사이의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를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 지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3]
식민 통치 이후 남겨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의 복잡한 연쇄를 이해하는 것은 후식민주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식민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 독립 투쟁 과정에서 겪는 정체성 문제, 구조적 불의, 토착 지식과 관습의 소멸 등은 식민주의의 장기적인 영향이다.
후식민주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며, 이론가들은 항상 공통된 정의 집합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류학 연구를 통해 식민 통치자들이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가정하에 식민화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식민 생활을 이해하려 할 수 있다. 더 깊이 있게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및 정치적 권력 관계, 그리고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화된 자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서사를 조사한다.
2. 1. 초기 역사
식민주의는 "문명의 확장"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서구 세계가 비서구 세계에 대해 자칭하는 인종적, 문화적 우월성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에르네스트 레낭은 저서 『지적·도덕 개혁』(1871)에서 제국적 수탁이 세계의 열등한 문화를 가진 유색 인종의 지적·도덕적 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인류의 인종들 사이에 신이 정한 자연스러운 조화가 가능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제국 식민지 내에서 할당된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위치, 그리고 경제적 역할을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6]19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그러한 인종주의적 집단 정체성 언어는 유럽과 미국 제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을 정당화하고 과도하게 확장된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적 상용어였다. 특히 극동 식민지화와 19세기 말 아프리카 분할에서 동질적인 유럽 정체성의 표상은 식민지를 정당화했다.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식민지를 계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당화하는 국가적 우월성 이론을 제시했다. 특히 프랑스 제국의 자칭 '문명화 사명'( la mission civilisatrice)은 어떤 인종과 문화는 삶에서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더 강력하고, 더 발전되고, 더 문명화된 인종은 "문명"이라는 고귀한 사상과 그 경제적 이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식민지화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7][8]
2. 2. 발전 과정
탈식민주의 이론은 탈식민화된 사람들이 문화적, 국가적, 민족적, 성별, 계급 기반 등 다양한 정체성 간의 문화적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탈식민주의적 정체성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체성은 식민 사회에 의해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권력을 부여받는다.[4]탈식민주의 문학에서 반정복 서사는 피지배 계급 식민지 주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인 정체성 정치를 분석한다. 즉, 식민 지배자들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창의적인 저항, 그러한 문화적 저항이 식민 사회의 수립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식민 지배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탈식민주의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신식민주의가 비서구 세계를 '타자'로 간주하는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적 사회 관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분석한다.[9]
원주민의 문화 유산과 식민 지배자들이 부과한 규범과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투쟁 중 하나이다. 이는 사람들과 공동체 모두에게 정체성 붕괴와 삶의 터전 상실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만들어진 계층적 사회 구조는 계속해서 권력 불평등과 불의를 지지해 왔으며, 이는 성별, 계급, 민족에 기반한 정체성 갈등에 기여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현재 정부, 언어, 교육 및 문화적 표현에 대한 논의에서 표출된다.[10]
3. 주요 특징 및 개념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남긴 유산을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판한다. 탈식민주의는 탈식민화된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데, 이 문제는 식민지배자가 식민지 주민에 대해 만든 문화적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식민 지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서 비롯된다.[2]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자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 즉 지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이론들을 무력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불균형적인 권력 관계를 바로잡고, 하층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3]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는 때때로 식민지배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만, 이는 문제가 있는 용어 사용으로 여겨진다. 당시의 역사적, 정치적 시기는 비판적 정체성 담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탈식민주의 비판에 의해 폐기되고 대체되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postcolonial)'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라는 용어는 탈식민화된 세계가 모순, 미완성 과정, 혼란, 혼종성(Hybridity) 등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11]
헬렌 길버트와 조앤 톰프킨스는 '탈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식민주의 종식 후 또는 독립 이후의 시기를 의미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식민주의의 담론, 권력 구조, 사회적 계층에 대한 참여와 다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12]
또한 '탈식민주의'는 탈식민화된 국가에 대한 모국의 신식민주의적 통제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권력 관계의 연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식민주의 논리의 문화적, 종교적 가정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13]
3. 1. 오리엔탈리즘
문화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1978년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탈리즘 이론을 제시했다.[16] 사이드는 서구 유럽이 세계를 "서구"와 "오리엔트"로 나누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사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서구의 오리엔트 묘사와 연구에 대한 미술사 용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사이드에 따르면, "우리와 그들"의 관계로 만들어진 문화적 표상들은 사회적 구성물이며, 서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사이드에 따르면 "서구"는 "동양"이라는 문화적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유럽인들이 중동, 인도, 아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독립적인 민족과 문화로 표현하는 것을 억압할 수 있었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 세계를 "동양"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묶어 축소시킨 것이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스트적 관점은 유럽 학자들이 오리엔트 세계를 서구 유럽과 반대로 열등하고, 비이성적이며, 야만적인 것으로 묘사하도록 만들었다. 반면 서구 유럽은 우월하고, 이성적이며, 문명화된 것으로 여겨졌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78)을 검토하면서, A. 마다반(1993)은 "그 책에서 사이드의 열정적인 논지는 이제 '거의 정경 연구'가 된 오리엔탈리즘을 세계관에서 동양과 서양의 반의론에 기반한 '사고 방식'으로, 그리고 오리엔트를 다루는 '기업 기관'으로 표현했다"고 말한다.[17]
철학자 미셸 푸코와 마찬가지로, 사이드는 권력과 지식이 서구인들이 "오리엔트에 대한 지식"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문화적 지식의 힘은 유럽인들이 오리엔트의 사람, 장소, 사물을 제국 식민지로 이름을 바꾸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13] 권력-지식 관계는 유럽 식민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하지만, "서구-오리엔트"라는 이분법적인 사회 관계에 대한 비판가들은 오리엔탈리즘의 설명력과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는 다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드는 유럽 서구가 "서구"라는 유럽 문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을 타자의 ''동질적인'' 형태로 이용했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로, 서구는 오리엔트를 자신의 반영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서구에 의한 오리엔트의 묘사는 현실에 기반한 것이 부족하다. 이 상상력 넘치는 해석은 오리엔트에 여성적 특성을 부여하고 서구의 자아 반영 내에 있는 환상에 영향을 미친다.
''오리엔탈리즘''(6쪽)에서 사이드는 "어원학(언어 역사 연구), 사전 편찬(사전 만들기), 역사, 생물학, 정치 및 경제 이론, 소설 쓰기 및 서정시"의 생산을 언급한다. 즉,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오리엔트를 이용하는 산업이 존재하며, 이러한 산업은 제도화되어 오리엔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낸다.[19] 이러한 학문 분야는 서구에서 정치적 자원과 싱크탱크를 종합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일반적인 담론 내에서 정상화되어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게 만든다.[20]
3. 2. 하위 주체 (Subaltern)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은 후기식민주의에서 '하위계층'이라는 용어를 정립하면서, 이 용어가 단순히 "억압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차이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21] 스피박은 노동 계급은 억압받지만 '하위계층'은 아니며, 대학 캠퍼스에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해서 '하위계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스피박은 차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헤게모니적 담론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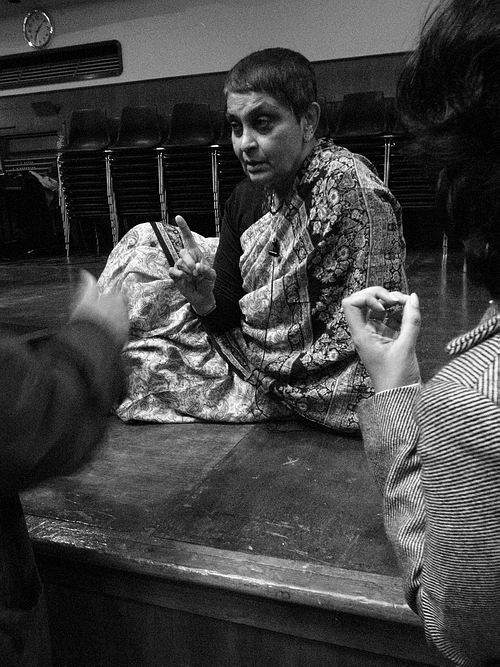
스피박은 '본질주의'와 '전략적 본질주의'라는 용어를 통해 하위계층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과정의 인식론적 위험과 사회적 기능을 설명했다. '본질주의'는 사회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반면 '전략적 본질주의'는 집단 간 담론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본질적 집단 정체성을 의미하며, 집단 내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최소화한다.[9]
스피박은 푸코의 '인식론적 폭력' 개념을 발전시켜 비서구적 세계관이 파괴되고 서구적 세계관이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하위계층(여성)은 항상 번역 과정에 갇혀 있어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식민 권력이 여성의 문화를 파괴함으로써 비서구적 세계관, 이해 및 지식이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9]
1600년 6월, 아프로-이베리아 여성 프란시스카 데 피게로아는 스페인 국왕에게 유럽에서 누에바 그라나다로 이주하여 딸과 재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아프리카 언어를 억압하고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공식 언어인 페닌술라 스페인어로 요청했다. 그녀는 식민 지배자에게 말할 때 성차별주의, 기독교 일신교, 비굴한 언어라는 스페인 문화적 필터를 자신의 목소리에 적용해야 했다.[22]
스피박은 하위계층을 "문화적 타자"로 무시하는 것을 경계하며, 서구가 자기 비판을 통해 식민주의적 관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9] 또한, 사회 과학에서 하위계층의 목소리를 통합하는 것은 "타자" 연구에 대한 비현실적인 반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사회 과학자들의 반지성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후기식민주의 연구는 하위계층을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식민지 문화적 묘사를 거부하며, 식민 반대 저항이 항상 식민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주장한다.
3. 3. 혼종성 (Hybridity)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저서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 1994)에서 통합된 인간 세계가 아닌, 분리되고 불평등한 문화로 구성된 인간 세계라는 관점이 "그리스도교 세계"(Christendom), "이슬람 세계"(The Islamic World), "선진국"(First World), "후진국"(Second World), "제3세계"(Third World)와 같은 허구적인 민족과 장소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영속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어적, 사회학적 환원주의(reductionism)에 맞서, 포스트콜로니얼 실천(Praxis)은 모호성이 진실과 진정성을 무효화하는 혼종적인 지적 공간의 철학적 가치를 확립한다. 따라서 '혼종성'(hybridity)은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타당성에 가장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철학적 조건이다.[23]3. 4. 인식론적 폭력
스피박은 서구 중심의 지식 체계가 비서구 사회의 고유한 지식과 문화를 억압하고 말살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푸코의 용어인 '인식론적 폭력'을 발전시키고 적용했다.[9] 이는 식민주의가 단순히 영토와 자원을 수탈하는 것을 넘어, 피식민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인식론적 폭력은 특히 여성과 관련이 깊다. 스피박에 따르면, 하위계층(여성)은 항상 번역 과정에 갇혀 있어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 식민 권력이 그녀의 문화를 파괴함으로써 그녀의 비서구적 세계관, 이해 및 지식이 사회적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9]일례로, 1600년 6월, 아프로-이베리아 여성인 프란시스카 데 피게로아(Francisca de Figueroa)는 스페인 국왕에게 유럽에서 누에바 그라나다로 이주하여 딸 후아나 데 피게로아(Juana de Figueroa)와 재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다. 하위계층 여성으로서 프란시스카는 자신의 모국어인 아프리카 언어를 억압하고, 식민지 라틴 아메리카의 공식 언어인 페닌술라 스페인어로 요청했다. 이처럼 하위계층 여성은 식민 지배자에게 말할 때 성차별주의, 기독교 일신교, 비굴한 언어라는 스페인 문화적 필터를 자신의 목소리에 적용해야 했다.[22]
3. 5. 신식민주의
탈식민주의는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종속 관계가 지속되는 현상을 '신식민주의'로 규정하고 비판한다. 신식민주의는 과거의 직접적인 식민 통치와 달리,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문화 산업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한다.[13]'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라는 용어는 탈식민화된 국가에 대한 모국의 신식민주의적 통제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는 비서구 세계의 식민화된 사람들에 대한 지식의 식민 정치(지식의 생성, 생산 및 분배)를 통제했던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권력 관계의 법적 연속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3] 식민주의 논리의 문화적, 종교적 가정은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활동적인 관행이며, 모국의 전 식민지 피지배자들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태도(노동력과 원자재의 경제적 원천)의 기초가 된다. 이는 독립 국가를 식민지배국과 연결하는, 교체 불가능한 용어로 작용하여, 국가들이 자체 정체성을 구축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독립(independence)을 박탈한다.
데릭 그레고리(Derek Gregory)는 저서 『식민주의의 현재(The Colonial Present)』에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지정학적 연관성을 추적하여 서구와 동구 세계 사이의 '우리 대 그들(us-and-them)'의 이분법적 관계로 연결한다. 타자에 대한 사상과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 연구를 바탕으로 그레고리는 경제 정책, 군사 기구, 다국적 기업을 오늘날 식민주의를 추동하는 수단으로 비판한다. 9.11 테러(September 11 attacks)와 같은 현대 사건을 사용하여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민 행위에 대한 공간적 이야기를 들려준다.[28]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시행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SAPs)은 일부 후기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현대판 식민주의(Colonialism)로 간주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무역 자유화, 은행, 의료, 교육 기관의 민영화를 요구한다.[59]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업들이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금 작물의 생산과 수출에 국한되어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더 많은 대출을 받고 높은 이자를 계속 지불하는 끝없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었다.[59]
4. 주요 이론가 및 저작
탈식민주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한 주요 이론가와 그들의 저작은 다음과 같다.
- 프랑츠 파농: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로, 검은 피부, 하얀 가면(1952), 지구의 불쌍한 자들(1961) 등의 저서를 통해 식민주의가 피식민 지배 민족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와 폭력성을 고발했다.
-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 비평가로,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서구 중심의 왜곡된 동양관을 비판했다.
- 가야트리 스피박: 하위계층 연구를 통해 제3세계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했으며, 『하층민은 말할 수 있는가?』(1988)를 저술했다.
-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1994)에서 문화적 혼종성 개념을 통해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했다.
- 폴 길로이(Paul Gilroy)
- 압둘라자크 구르나(Abdulrazak Gurnah)
- 저우레이(周蕾 (레이 저우))
- 스튜어트 홀(Stuart Hall)
- 강상중: 일본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가이다.
- 본바시 테츠야(本橋哲也)
- 키쿠치 나츠노: 젠더론 및 일본 식민지주의 비판적 관점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이론을 연구한다.
- 노무라 히로야(野村浩也)
4. 1. 프란츠 파농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프란츠 파농은 검은 피부, 하얀 가면(1952)과 지구의 불쌍한 자들(1961) 등의 저서를 통해 식민주의가 피식민 지배 민족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와 폭력성을 고발했다.[15] 파농은 식민주의의 본질이 식민지 주민들의 "인간성의 모든 속성"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4] 그는 식민 지배가 원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노예근성을 주입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동원한다고 분석했다.파농은 식민지 해방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원주민들이 식민 지배에 폭력적으로 저항해야 하며, 이러한 저항은 정신적으로 카타르시스적인 행위로서, 원주민의 정신(심리)에서 식민지 노예근성을 제거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파농은 알제리 민족해방전선(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의 일원으로서 알제리 전쟁(1954~62)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의 사상은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언어, 주관성, 현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15] 파농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문명을 채택하고 그 언어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민 상황에서는 식민지 존재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부과된 언어를 채택하고 구사하도록 강요받으면서, 식민화된 세계와 문명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분석했다.[15]
4. 2.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1978년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탈리즘 이론을 제시하여 E. 산 후안 주니어에게 "탈식민주의 이론과 담론의 창시자이자 영감을 주는 수호성인"으로 평가받는다.[16] 사이드는 서구 유럽이 세계를 "서구"와 "오리엔트"로 나누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항적 사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서구의 오리엔트 묘사와 연구에 대한 미술사 용어)의 의미를 발전시켰다.사이드는 "우리와 그들"의 이항적 관계로 만들어진 문화적 표상들이 사회적 구성물이며, 서로 상호 구성적이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서구"는 "동양"이라는 문화적 개념을 만들었고, 이는 유럽인들이 중동, 인도 아대륙, 아시아 전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독립적인 민족과 문화로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게 했다. 오리엔탈리즘은 비서구 세계를 "동양"이라는 동질적인 문화로 축소했고, 이는 식민 유형의 제국주의에 기여했다. 유럽 학자들은 오리엔트 세계를 서구 유럽과 반대로 열등하고, 비이성적이며, 야만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A. 마다반(1993)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1978)을 검토하며, "그 책에서 사이드의 열정적인 논지는 이제 '거의 정경 연구'가 된 오리엔탈리즘을 세계관에서 동양과 서양의 반의론에 기반한 '사고 방식'으로, 그리고 오리엔트를 다루는 '기업 기관'으로 표현했다"고 평가한다.[17]
미셸 푸코와 마찬가지로 사이드는 권력과 지식이 서구인들이 "오리엔트에 대한 지식"을 주장하는 지적인 이항 관계의 구성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문화적 지식의 적용된 권력은 유럽인들이 오리엔트의 사람, 장소, 사물을 제국 식민지로 통제하게 했다.[13]
동질적인 "서구-오리엔트" 이항적 사회 관계에 대한 비평가들은 오리엔탈리즘의 설명 능력과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되는 변형이 있다고 제안한다. 사이드는 유럽 서구가 "서구"라는 응집력 있는 집단적 유럽 문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오리엔탈리즘을 타자의 ''동질적인'' 형태로 적용했다고 답한다.
서구는 무의식적으로 오리엔트를 자아의 반영으로 구성하며, 오리엔트에 대한 묘사는 물질적 속성이 부족하다. 이 상상력 넘치는 해석은 오리엔트에 여성적 특성을 부여하고 서구의 자아 반영 내 환상에 영향을 미친다.
''오리엔탈리즘''(6쪽)에서 사이드는 "어원학(언어 역사 연구), 사전 편찬(사전 만들기), 역사, 생물학, 정치 및 경제 이론, 소설 쓰기 및 서정시"의 생산을 언급한다. 토착적 이해가 부족한, 자신의 주관적인 목적을 위해 오리엔트를 이용하는 전체 산업이 제도화되고 명백한 오리엔탈리즘이나 오리엔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편찬하는 데 사용된다.[19]
이러한 학문 분야는 서구에서 정치적 자원과 싱크탱크를 종합한다. 오리엔탈리즘은 일반적인 담론 내에서 정상화되어 사람들이 잠재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그것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만든다.[20]
4. 3. 가야트리 스피박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은 후기식민주의에서 '하위계층'이라는 용어를 정립하면서, 이 용어가 지나치게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했다. 스피박은 '하위계층'이 단순히 억압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즉 차이의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21]스피박은 본질주의와 전략적 본질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후기식민주의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했다. 본질주의는 이질적인 사회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고정관념적인 표상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반면, 전략적 본질주의는 사람들 사이의 담론에서 사용되는 일시적인 본질적 집단 정체성을 의미한다. 전략적 본질주의는 집단 간 담론에서 대중 다수에게 더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위계층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 본질주의는 사회 집단 내의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실제 기능에서는 집단 간 다양성을 일시적으로 최소화한다는 점이 본질주의와 다르다.[9]
스피박은 비서구적 세계관의 파괴와 서구적 세계관의 지배를 설명하기 위해 푸코의 '인식론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인식론적 폭력은 "하위계층(여성)은 항상 번역 과정에 갇혀 있어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 권력이 비서구적 세계관, 이해, 지식을 사회적 주변부로 밀어냈기 때문이다.[9]
스피박은 1988년에 출간된 『하층민은 말할 수 있는가?』에서 식민 지배와 가부장제의 이중 억압에 놓인 제3세계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그들의 역사와 경험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4. 호미 바바
호미 바바(Homi K. Bhabha)는 저서 『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 1994)에서, 통합된 인간 세계가 아닌 분리되고 불평등한 문화로 구성된 인간 세계라는 관점이 "그리스도교 세계"(Christendom), "이슬람 세계"(The Islamic World), "선진국"(First World), "후진국"(Second World), "제3세계"(Third World)와 같은 허구적인 민족과 장소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영속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어적, 사회학적 환원주의에 맞서, 포스트콜로니얼 실천(Praxis)은 모호성이 진실과 진정성을 무효화하는 혼종적인 지적 공간의 철학적 가치를 확립한다. 따라서 '혼종성(hybridity)'은 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타당성에 가장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철학적 조건이다.[23]5. 탈식민주의의 적용 및 확장
탈식민주의는 식민 통치 이후 남겨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의 복잡한 연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식민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 독립을 위한 투쟁 등 광범위한 경험을 포함하며, 식민 지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체성 문제, 구조적 불의, 토착 지식 및 관습의 소멸과 같은 식민주의의 장기적인 영향에 직면한다.
탈식민주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하며, 이론가들은 항상 공통된 정의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학 연구를 통해 식민 통치자들이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가정하에 식민화된 사람들의 관점에서 식민 생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구축하려고 할 수 있다. 더 깊이 있게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지속시키는 사회적 및 정치적 권력 관계, 그리고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화된 자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서사를 조사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사 연구와 겹칠 수 있으며, 역사서술, 정치학, 철학, 사회학, 인문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활용한다.[4]
탈식민주의 이론은 탈식민화된 사람들이 다양한 정체성(문화적, 국가적, 민족적, 성별 및 계급 기반) 간의 문화적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탈식민주의적 정체성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원주민의 문화 유산과 식민 지배자들이 부과한 규범과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투쟁 중 하나이다. 이는 정체성 붕괴와 삶의 터전 상실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만들어진 계층적 사회 구조는 권력 불평등과 불의를 지속시켜 성별, 계급, 민족에 기반한 정체성 갈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이며, 현재 정부, 언어, 교육 및 문화적 표현에 대한 논의에서 표출된다.[10]
5. 1. 탈식민주의 문학 연구
후기식민주의 문학 연구는 과거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생산한 문학과, 이전의 모국과 현대적 후기식민주의적 관계(예: 프랑코포니와 영연방)를 맺고 있는 탈식민 국가들의 문학을 다루는 문학 이론이다.[34]후기식민주의 문학 비평은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인이 쓴 문학을 포괄하며, 그 주제는 식민지 인민과 그들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탈식민주의 문학에서 반정복 서사는 피지배 계급 식민지 주민들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인 정체성 정치를 분석한다. 즉, 식민 지배자들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창의적인 저항, 그러한 문화적 저항이 식민 사회의 수립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식민 지배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탈식민주의적 정체성을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신식민주의가 비서구 세계를 '타자'로 간주하는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적 사회 관계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분석한다.
J. M. 쿠체의 야만인을 기다리며(1980)는 식민 개척민들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다.[35]
후기식민주의 문학 연구는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36]
# 탈식민 국가 연구
# 탈식민 국가 정체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국가 연구
첫 번째 범주는 탈식민 국가에서 민족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내재된 내부적 과제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두 번째 범주는 일반적으로 "국가 보호"라는 선동 정치(데마고기)로 나타나는 민족적 편협성으로 인해 시민 및 민족 통일성이 쇠퇴하는 것을 제시하고 분석한다. 이는 우리와 그들로 이분화된 사회 관계의 변형이다. 탈식민 국가의 "국가 문화"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가부장제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의할 때 시민 및 국가 통일성은 쇠퇴한다.
주요 탈식민주의 문학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 존 엔케몽 켄가송(John Nkemngong Nkengasong) (1959–2023)
-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 (1930–2013)
-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Chimamanda Ngozi Adichie)[67] (1977–)
- 아마 아타 아이두(Ama Ata Aidoo) (1940–2023)
- 마리아마 바(Mariama Bâ) (1929–1981)
- 지아니나 브라스키(Giannina Braschi) (1953–)
- 에드위지 단티카(Edwidge Danticat) (1969–)
- 부치 에메체타(Buchi Emecheta) (1944–2018)
-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 (1956–)
- 압둘라작 구르나(Abdulrazak Gurnah) (1948–)
- 모신 하미드(Mohsin Hamid) (1971–)
- 자메이카 킨케이드(Jamaica Kincaid) (1949–)
- 주파 라히리(Jhumpa Lahiri) (1967–)
- 벤 오크리(Ben Okri) (1959–)
- 마이클 온다아제(Michael Ondaatje) (1943–)
- 아룬다티 로이(Arundhati Roy) (1961–)
- 장 리스(Jean Rhys) (1890–1979)
- 살만 루슈디(Salman Rushdie) (1947–)
- 샘 셀본(Sam Selvon) (1923–1994)
- 우스만 셈베네(Ousmane Sembène) (1923–2007)
- 밥시 시드와(Bapsi Sidhwa) (1938–)
- 자디 스미스(Zadie Smith) (1975–)
- 워레 소잉카(Wole Soyinka) (1934–)
- 나딘 고르디머(Nadine Gordimer) (1923–2014)
- 응구기 와 티옹오(Ngugi wa Thiong'o) (1938–)
- 캐드웰 턴불(Cadwell Turnbull) (1987–)
- 데릭 월콧(Derek Walcott) (1930–2017)
5. 2. 지역별 연구
탈식민주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등 다양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각 지역의 특수한 식민 경험과 탈식민 상황을 고려하여, 탈식민주의 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발전하고 있다.- 동유럽: 폴란드 분할(1772~1918)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동유럽 국가 점령은 "백인" 식민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39]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제국 등은 이웃 지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자원을 착취했으며, 문화를 파괴하고 제국 언어로 현지 주민들을 재교육하려 했다.[39] 이는 서유럽 열강의 해외 영토 정복과 유사하다. 에바 M. 톰프슨의 『제국적 지식: 러시아 문학과 식민주의』(2000)는 동중부 및 동유럽 탈식민주의 연구의 시작을 알렸다.[40]
-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47][48] 1494년 드로헤다 법령으로 아일랜드 의회는 영국 정부에 종속되었고, 1801년 아일랜드 왕국은 대영 제국과 합병되었다.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했지만,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일부로 남아있다.[47][48] 아일랜드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영국에 예속되었고, 게일족 아일랜드인은 야만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영토 분할과 독립 후 투쟁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다른 식민 지역과 유사하다.[49]
북아일랜드 문제(1969~1998)는 가톨릭/게일족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과 개신교/스코틀랜드-아일랜드인/앵글로-아일랜드인 연합주의자들 간의 갈등으로, 후식민지 갈등으로 묘사된다.[55][56][57]
- 기타 지역: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시행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은 현대판 식민주의로 간주되기도 한다.[59]
5. 2. 1. 아시아
아시아 지역은 유럽 열강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으며, 탈식민 이후에도 신식민주의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통킹, 안남, 코친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의 다섯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코친차이나(베트남 남부)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최초의 지역이었고, 사이공은 1859년에 정복되었으며, 1887년에는 인도차이나 연방이 설립되었다.[37] 1924년, 응우옌 아이 꾸옥(호찌민)은 프랑스 식민지배에 대한 최초의 비판적인 글인 ''Le Procès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Le Procès de la Colonisation française|프랑스 식민지배에 대한 고발프랑스어)을 썼다.[37]
인도의 경우, 1997년 인도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산티니케탄: 맥락적 근대성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전시회가 열렸다.[24] 이 전시회에서는 '맥락적 근대성'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난달랄 보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람킨카르 바이즈, 베노드 베하리 무케르지의 작품을 이해하는 후식민주의적 비평 도구로 자리 잡았다.[25] 이들은 유럽 중심적인 근대성 개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역사적 위치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재참여를 통해 대안적인 근대성을 추구했다.[26]
트린 티 민하는 문학, 영화, 교육 등 다양한 표현 수단을 통해 후식민주의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그녀는 다큐멘터리 영화 ''Reassemblage''(1982)에서 인류학을 서구 남성 패권적 이데올로기로 탈구조화하려 시도했으며,[37] 1989년에는 ''Woman, Native, Other: Writing Postcoloniality and Feminism''을 통해 구전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37]
디페시 차크라바르티는 『지방으로서의 유럽』(2000)에서 비서구 민족과 문화에 대한 유로중심적인 서구 학문에 맞서, 서구 유럽을 세계의 다른 문화들과 문화적으로 동등한 "많은 지역들 중 하나"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7]
5. 2. 2. 아프리카

19세기 후반, 아프리카 분할(1874~1914)은 유럽 제국들의 중상주의 식민주의의 마지막 단계였지만, 아프리카인들에게는 다른 식민지화된 비서구 세계보다 더 큰 결과를 가져왔다.[38] 유럽 제국들은 식민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강과 땅이 통과할 수 없는 곳에 철도를 부설했다. 영국의 제국주의적 철도 건설 노력은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려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식민지 북아프리카(카이로)와 남아프리카(케이프타운)를 연결하는 데만 성공했다.
유럽인들은 아샨티 제국, 베냉 제국, 다호메이 왕국, 부간다 왕국(우간다), 콩고 왕국 등 다양한 아프리카 문명을 만났고, 이들은 유럽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믿음 아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합병되었다.
케냐 작가인 응구기 와 티옹오는 동아프리카의 식민 제국주의 경험에 대한 최초의 탈식민주의 소설인 『울지마라, 아이야』(1964)와 『마음의 탈식민화: 아프리카 문학에서 언어의 정치』(1986)를 썼다.[38] 마우마우 반란(1952~1960)을 배경으로 한 『강 사이에서』(1965)에서 그는 아프리카 종교 문화의 탈식민주의적 문제와 케냐와 아프리카 대부분에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기독교의 강요의 결과를 다룬다.
아프리카의 탈식민 국가에서는 아프리카인과 비아프리카인이 성별, 민족, 계급, 언어, 연령, 가족, 직업, 종교, 국가 등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38]
5. 2. 3. 중동

P.R. 쿠마라스와미(P.R. Kumaraswamy)는 그의 에세이 "나는 누구인가?: 중동의 정체성 위기(Who Am I?: The Identity Crisis in the Middle East)"(2006)에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고통받았다고 말한다.[37]
독립과 식민주의의 종식은 중동의 사회적 분열과 전쟁(내전과 국제전)을 종식시키지 못했다.[37] 《아랍 민주주의의 탐구: 담론과 반담론(The Search for Arab Democracy: Discourses and Counter-Discourses)》(2004)에서 라르비 사디키(Larbi Sadiki)는 중동의 국가 정체성 문제가 유럽 제국들이 식민지의 정치적 경계를 설정할 때 지역의 역사와 원주민들이 준수했던 지리적, 부족적 경계를 무시한 오리엔탈리즘적 무관심의 결과라고 말한다.[37]
이라크와 요르단과 같은 곳에서는 새로운 주권 국가의 지도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왔고, 식민지의 이익과 약속에 맞게 조정되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만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철수 후 제국주의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유럽화된 식민지 피지배자]들에게 넘겨졌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탈식민화 이후 재발명되어야 했다.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식민지 시대의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포스트 식민주의 정체성은 힘에 의존한다.[37]
5. 2. 4. 동유럽
폴란드 분할(1772~1918)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동유럽 국가 점령은 오랫동안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에게 간과되어 온 "백인" 식민주의의 한 형태였다.[39]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제국,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제국 등 유럽 제국들의 이웃 지역(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지배는 군사 침략, 인적 및 천연 자원 착취, 문화 파괴, 제국 언어로 현지 주민들을 재교육하려는 노력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인종적 차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열강의 해외 영토 정복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39]동중부 및 동유럽의 탈식민주의 연구는 에바 M. 톰프슨의 ''제국적 지식: 러시아 문학과 식민주의''(2000)로 시작되었으며,[40] 이후 알렉산데르 피우트, 한나 고스크, 비올레타 켈레르타스,[41] 도로타 코워제이치크,[42] 야누시 코렉,[43] 다리우시 스코르체프스키,[44] 보그단 슈테파네스쿠,[45] 토마시 자리츠키[46] 등의 연구가 이어졌다.
5. 2. 5.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다.[47][48] 특히, 1494년의 드로헤다 법령은 아일랜드 의회를 영국 정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801년, 아일랜드 왕국은 대영 제국과 합병되어 영국의 일부가 되었다.1922년, 아일랜드의 대부분은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웨스트민스터 법령, 1931과 새로운 아일랜드 헌법 제정을 거쳐 1937년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 1949년에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는 여전히 영국의 일부로 남아있다.[47][48]
많은 학자들은 아일랜드의 경험과 다른 식민 지역의 경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지적한다.[49]
2003년 클레어 캐롤은 롤리, 길버트, 드레이크와 같은 인물들의 아일랜드에서의 활동이 아메리카에서의 활동에 대한 '예행연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인들은 아일랜드인을 북아메리카 원주민보다 더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했다고 한다.[54]
레이첼 세오이게는 2017년에 아일랜드어가 사회 문화적, 정치적 삶에서 자아 상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여겨진 아일랜드어는 사람들의 '낙후'의 원인으로 간주되었고, 자신의 언어를 고수하는 것은 죽음, 추방, 빈곤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시머스 디인이 1840년대 아일랜드 대기근에 대한 기록을 분석하면서 확인되었다. 이 시기 굶주리고 이주하고 사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일랜드어가 경제와 사회의 황폐화에 연루되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아일랜드어는 근대성에서 추방된 사람들의 약점으로 인식되었고, 그들의 모국어는 그들이 '전통'과 '낙후성'을 버리고 영어가 근대성, 진보, 생존의 언어인 '문명화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여겨졌다.[51]
북아일랜드 문제(1969~1998)는 주로 가톨릭과 게일족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아일랜드 공화국과의 통합을 원함)과 주로 개신교 스코틀랜드-아일랜드인과 앵글로-아일랜드인 연합주의자들(영국 잔류를 원함) 사이의 갈등으로, 후식민지 갈등으로 묘사된다.[55][56][57] 자코뱅에서 다니엘 핀은 이 갈등을 "오래된 증오"로 묘사하며 제국주의적 맥락을 무시하는 보도를 비판했다.[58]
6. 탈식민주의에 대한 비판
인도계 미국인 마르크스주의 학자 비벡 치버는 저서 《포스트콜로니얼 이론과 자본주의의 유령》에서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의 몇 가지 기본적인 논리를 비판한다. 치버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아이자즈 아흐마드의 비판[72]과 서브얼터너 스터디스 학자들에 대한 스미트 사르카르의 비판[73]을 바탕으로, 서브얼터너 스터디스 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요한 역사적 주장에 초점을 맞춰 반박한다. 그는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이 문화를 본질화하고 고정적이며 정적인 범주로 묘사하며,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메울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하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망"이나 "보편적인 이익"을 부정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계몽주의 가치관 전체를 유럽중심주의로 규정하는 포스트콜로니얼의 경향도 비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론은 "문화적 본질주의를 부활시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는커녕 오리엔탈리즘을 옹호하는 것으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기억될 것이다.[74]
6. 1. 보편적 가치 훼손 비판
비벡 치버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탈식민주의 이론이 문화를 본질주의적으로 규정하고,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편적 가치와 계몽주의적 이상을 부정한다고 비판한다.[63] 치버는 그의 저서 《포스트콜로니얼 이론과 자본의 유령》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이 모든 계몽주의 가치를 유럽중심주의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문화적 본질주의를 부활시키고 오리엔탈리즘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74]6. 2. 국가 정체성 고착화 비판
탈식민주의 연구는 탈식민화 이후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확립하는 데 국가 정체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탈식민화된 사회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75]모로코 학자 빈 아브드 알 알리(Bin 'Abd al-'Ali)는 나지흐 아유비(Nazih Ayubi)의 저서 "과장된 아랍 국가(Overstating the Arab State)"(2001)에서 현대 학계의 중동 연구 분야에서 "정체성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주제라고 주장했다.[64][75] 그러나 쿠마라스와미(Kumaraswamy)와 사디키(Sadiki)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확실한 국가 정체성이라는 사회학적 문제가 현대 중동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측면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76] 아유비는 빈 압드 알 알리가 언급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옹호하는 사회 계급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64][76]
모하메드 살라 에딘 마디우(Mohamed Salah Eddine Madiou)는 그의 에세이 "탈식민주의의 죽음: 창시자의 서문(The Death of Postcolonialism: The Founder's Foreword)"에서 학문적 연구이자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인 탈식민주의가 "비참한 실패"라고 주장한다. 그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탈식민주의 학문과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 학문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마디우는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The Death of the Author)"과 스피박의 "학문의 죽음(Death of a Discipline)"이라는 제목을 빌려, 탈식민주의는 오늘날 식민주의를 연구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죽었지만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마디우는 학문 분야를 탈식민주의가 죽었다고 간주하는 명확한 이유 하나로 팔레스타인과 같은 심각한 식민지 사례를 회피하는 것을 꼽는다.[65][77]
7. 한국 사회와 탈식민주의
한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 지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광복 이후에도 분단과 전쟁,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등 탈식민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탈식민주의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경험을 재조명하고, 분단과 신식민주의적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왔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억압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 탈식민주의적 과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삼고 있다.
7. 1. 한국의 탈식민주의 연구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백낙청, 임철규 등의 학자들은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문학을 분석하고, 새로운 역사 인식과 민족 담론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탈식민주의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참조
[1]
서적
The Settler Colonial Present
Palgrave Macmillan UK
2015
[2]
간행물
Critical Approaches to Continental Philosophy: Intellectual Community, Disciplinary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Inclusion
https://www.academia[...]
2019
[3]
서적
Post-Colonial Studies: The Key Concepts
Routeledge
2000
[4]
웹사이트
What is Postcolonial Studies?
https://postcolonial[...]
Masood Raja
2019-04-02
[5]
웹사이트
TRANS Nr. 11: Paul Michael Lützeler (St. Louis): From Postmodernism to Postcolonialism
http://www.inst.at/t[...]
[6]
서적
Nationalism, Human Rights, and Interpretation
2000
[7]
서적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enguin Books
1998
[8]
서적
The Clash of Definitions
2000
[9]
서적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AGE Publications
[10]
웹사이트
Post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Pdf 11
https://groups.googl[...]
[11]
서적
The Pre-occupation of Postcolonial Studies
https://books.google[...]
Duke University Press
2000
[12]
서적
Post-Colonial Drama: Theory, Practice, Politics
Routledge
[13]
서적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AGE Publications
[14]
서적
War and world politics
https://books.google[...]
2005
[15]
백과사전
Frantz Fanon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9
[16]
학술지
The Limits of Postcolonial Criticism: The Discourse of Edward Said
https://www.marxists[...]
1998-11-12
[17]
학술지
Review: Edward Said: The Exile As Interpreter
[18]
서적
1978
[19]
서적
Imperial Fictions: Europe's Myths of Orient
Pandora Press
1994
[20]
서적
Beginning Postcolonialism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10
[21]
간행물
Interview With Gayatri Chakravorty Spivak: New Nation Writers Conference in South Africa
https://web.archive.[...]
1992
[22]
서적
Afro-Latino Voices: Narratives from the Early Modern Ibero–Atlantic World, 1550–1812
Hacket Publishing Company
[23]
서적
1994
[24]
웹사이트
Santiniketan: The Making of a Contextual Modernism – Asia Art Archive
http://www.aaa.org.h[...]
[25]
뉴스
Finding an expression of its own
http://www.frontline[...]
[26]
웹사이트
humanities underground » All The Shared Experiences Of The Lived World II
http://humanitiesund[...]
[27]
간행물
Overcoming Polarized Modernities: Counter-Modern Art Education: Santiniketan, The Legacy of a Poet's School
http://www.huichawai[...]
[28]
서적
The Colonial Present: Afghanistan, Palestine, Iraq
Blackwell Pub
2004
[29]
서적
Rethinking Postcolonialism
Palgrave Macmillan
[30]
서적
The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31]
서적
The Greek Heritage in Victorian Britain
https://archive.org/[...]
Yale University Press
[32]
서적
Sur l'Algérie
Flammarion
[33]
서적
The Expansion of England (188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4]
서적
The Penguin Dictiona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98
[35]
학술지
Oost-Indische spiegel. Wat Nederlandse schrijvers en dichters over Indonesië hebben geschreven vanaf de eerste jaren der Compagnie tot op heden
http://www.dbnl.org/[...]
Querido
[36]
서적
Postcolonialisms: An Anthology of Cultural Theory and Criticism
https://books.google[...]
Rutgers University Press
2016-02-23
[37]
서적
Overstating the Arab State
I.B. Tauris
[38]
간행물
Extravagant Postcolonialism: Ethics and Individualism in Anglophonic, Anglocentric Postcolonial Fiction; Or, 'What was (this) Postcolonialis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9]
학술지
Is the Post- in Postcolonial the Post- in Post-Soviet? Toward a Global Postcolonial Critique
https://www.mlajourn[...]
2001
[40]
서적
Imperial Knowledge. Russian Literature and Colonialism
https://archive.org/[...]
Greenwood Press
[41]
서적
Baltic Postcolonialism
Brill
[42]
학술지
On Colonialism, Communism and East-Central Europe – some reflections
https://www.tandfonl[...]
2012
[43]
서적
From Sovietology to Postcoloniality: Poland and Ukraine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Södertörns högskola
[44]
서적
Polish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A Postcolonial Perspectiv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Boydell & Brewer
[45]
학술지
Reluctant Siblings: Notes on the Analogy between Post- communist and Postcolonial Subalterns
2012
[46]
서적
Ideologies of Eastnes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Routledge
[47]
웹사이트
Ireland and Postcolonial Theory
https://undpress.nd.[...]
[48]
웹사이트
Postcolonial Ireland
https://oxford.unive[...]
Oxford University Press
[49]
학술지
Modern Ireland: Post-Colonial Society or Post-Colonial Pretensions?
http://www.jstor.org[...]
[50]
학술지
Ireland and Irishness: The Contextuality of Postcolonial Identity
https://pureadmin.qu[...]
[51]
웹사이트
The Irish language in postcolonial perspective
https://archive.disc[...]
2017-06-06
[52]
PhD thesis
Fanon's one big idea: Ireland and postcolonial studies
https://dspace.mic.u[...]
Mary Immaculate College, University of Limerick
2004-06-21
[53]
웹사이트
The Irish Republic as 'Postcolonial' Polity
https://oxford.unive[...]
Oxford University Press
[54]
학술지
Ireland and Postcolonial Theory (review)
https://muse.jhu.edu[...]
2004-06-21
[55]
학술지
Postcolonialism and Stories of the Irish Troubles
http://www.jstor.org[...]
[56]
BA thesis
It's Not Paddy: Cinematic Portrayals of Irish Colonial Conflicts
https://digitalcommo[...]
Bucknell University
2017-05-10
[57]
학술지
The Impact of British Colonialism on Irish Catholicism and National Identity: Repression, Reemergence, and Divergence
http://journals.open[...]
2010-06-30
[58]
웹사이트
Ireland's National Conflict Is About Imperialism as Well as Sectarianism
https://jacobinmag.c[...]
[59]
웹사이트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and human well-being
http://journals2.sch[...]
2016-02-10
[60]
서적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https://resilience2t[...]
Wiley-Blackwell
[61]
서적
In Theory
Verso
[62]
서적
Writing Social History
Oxford India
[63]
웹사이트
Who speaks for the Subaltern?
https://www.jacobinm[...]
jacobinmag
[64]
서적
Overstating the Arab State
I.B. Tauris
[65]
학술지
The Death of Postcolonialism: The Founder's Foreword
https://journals.lib[...]
2021-11-11
[66]
서적
The Case Against French Colonization
http://www.leinsdorf[...]
Pentland Press
[67]
웹사이트
Half of a Yellow Sun
https://www.goodread[...]
[68]
웹사이트
Colonialism is Doomed
https://www.marxists[...]
[69]
웹사이트
The White-Savior Industrial Complex
https://www.theatlan[...]
2012-03-21
[70]
웹사이트
What is Postcolonial Studies?
https://postcolonial[...]
Masood Raja
2019-04-02
[71]
웹사이트
TRANS Nr. 11: Paul Michael Lützeler (St. Louis): From Postmodernism to Postcolonialism
http://www.inst.at/t[...]
[72]
서적
In Theory
Verso
1993
[73]
서적
Writing Social History
Oxford India
1997
[74]
웹사이트
Who speaks for the Subaltern?
https://www.jacobinm[...]
jacobinmag
[75]
서적
Overstating the Arab State
I.B. Tauris
2001
[76]
서적
Overstating the Arab State
I.B. Tauris
2001
[77]
논문
The Death of Postcolonialism: The Founder's Foreword
https://journals.lib[...]
2021-11-1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