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마굽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브라마굽타는 598년, 현재 인도 라자스탄 주 빈말 지역에서 태어난 인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다. 그는 차우다 왕조의 통치자 비야그라무카 치세에 활동했으며, 힌두교 신앙을 가졌다. 628년에는 수학, 천문학, 대수학 등을 다룬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탄타를 저술했고, 이후 칸다카디야카를 저술했다. 브라마굽타는 0과 음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일차 및 이차 방정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수학 분야에 기여했으며, 브라마굽타의 공식과 정리, 이중 제곱 항등식 등 기하학 분야에서도 업적을 남겼다. 그의 저술은 아랍 세계로 전파되어 십진법과 수학적 지식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7세기 수학자 - 이시도루스 히스팔렌시스
이시도루스 히스팔렌시스는 서고트 왕국의 문화 부흥을 이끈 세비야 대주교이자 학자, 저술가로서, 20권의 백과사전 《어원》을 통해 중세 시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이자 교회 학자로 추존되고 인터넷의 수호 성인으로도 지정되었다. - 브라마굽타 - 브라마스푸타싯단타
브라마스푸타싯단타는 7세기 인도 수학자 브라마굽타가 저술한 천문학과 수학 서적으로, 숫자 0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고 브라마굽타의 공식 등 수학적 개념을 담아 이슬람 세계 학문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 브라마굽타 - 브라마굽타 공식
브라마굽타 공식은 7세기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굽타가 제시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며,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와 반둘레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668년 사망 - 지엄 (수나라)
지엄은 수나라 말기와 당나라 초기에 활동하며 화엄경과 유식학에 심취하여 화엄 교학을 발전시키고 화엄종이 중국 불교의 주요 종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한 승려이자 화엄종의 실질적인 개창자로 평가받는다. - 668년 사망 - 콘스탄스 2세
콘스탄스 2세는 641년부터 668년까지 동로마 제국을 통치했으며, 이슬람 세력의 확장과 종교적 갈등 속에서 영토 상실과 로마 교황과의 갈등을 겪었으며, 시칠리아에서 암살당했다.
2. 생애와 시대적 배경
브라마굽타는 자신의 기록에 따라 598년에 태어났다. 그는 차우다 왕조의 비야그라무카(Vyagrahamukha) 왕이 다스리던 구르자라데샤[7]의 수도 빌라마라(Bhillamāla, 현재 인도 라자스탄 주 빈말)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슈누굽타(Jishnugupta)였으며, 그는 샤이바 힌두교도였다.[8] 당시 빌라마라는 서인도의 주요 왕국 수도이자 수학과 천문학의 중심지였으며, 브라마굽타가 활동하던 시기는 6세기경 굽타 왕조가 쇠퇴하고 인도 아대륙이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때였다.
브라마굽타는 생애의 상당 부분을 고향 빌라마라에서 보내며 활동했다. 그는 당시 인도 천문학의 주요 학파 중 하나인 ''브라마팍샤(Brahmapaksha)'' 학파의 천문학자로서, 인도의 전통적인 천문학 문헌인 ''시단탄타''와 아리아바타 1세, 바라하미히라 등 여러 학자들의 저술을 연구했다.
628년, 30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인 ''브라마스푸타시단탄타''('브라마의 개정된 논문')를 완성했다. 이 책은 기존 브라마팍샤 학파의 이론을 개정하면서 천문학뿐만 아니라 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알고리즘 등 수학에 대한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브라마굽타는 인도 중부의 주요 천문학 중심지였던 아반티, 즉 우자인으로 이주했다. 665년, 67세의 나이에는 학생들을 위한 실용 천문학 안내서인 ''칸다카디야카''를 저술했다. 그는 665년 이후, 668년경에 우자인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활동 시기는 중국의 승려 현장이 인도를 여행했던 시기(629년-645년)와 겹친다.
브라마굽타의 수학적 업적은 후대의 인도 수학자 바스카라 2세 등에 의해 계승되었으며, 그의 저술은 8세기 압바스 왕조 시대에 아랍어로 번역되어 알콰리즈미와 같은 학자들을 통해 십진법과 인도의 산술 지식이 이슬람 세계와 유럽으로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0][11] 과학사가 조지 사르톤은 브라마굽타를 "그의 민족 중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그의 시대 최고의 과학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2. 1. 출생과 가계
브라마굽타는 598년에 태어났다. 그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탄타''에는 “샤카력 550년(서기 628년)에 지슈누(Jiśṇu)의 아들 브라마굽타, 나이 30세가 훌륭한 수학자와 천문학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이 책을 만들어 바친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통해 출생 연도를 알 수 있다.그는 현재 인도 라자스탄 주 빈말에 해당하는 빌라마라(Bhillamāla)에서 태어났다.[7] 당시 빌라마라는 차우다 왕조의 비야그라무카(Vyagrahamukha) 왕이 다스리던 구르자라데샤의 수도였다.[7] 구르자라데샤는 서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왕국으로, 현재의 남부 라자스탄 주와 북부 구자라트 주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빌라마라는 수학과 천문학 연구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브라마굽타의 아버지는 지슈누굽타(Jishnugupta)였으며, 그는 힌두교도, 특히 샤이바(Shaivite) 신자였다.[8]
브라마굽타는 생애의 상당 부분을 고향 빌라마라에서 보내며 활동했다. 이 때문에 후대의 주석가 프리투다카 스와민(Prithudaka Svamin)은 그를 '빌라마라의 스승'이라는 의미의 '빌라마라차리아(Bhillamalacharya)'라고 불렀다. 그는 당시 인도의 4대 천문학파 중 하나인 ''브라마팍샤(Brahmapaksha)'' 학파의 천문학자가 되었다. 그는 인도의 전통적인 다섯 ''시단탄타''와 아리아바타 1세, 라타데바(Latadeva), 프라디움나(Pradyumna), 바라하미히라, 심하(Simha), 스리세나(Srisena), 비자야난딘(Vijayanandin), 비슈누찬드라(Vishnuchandra) 등 다른 천문학자들의 저술을 연구했다.
628년, 30세의 나이에 그는 빌라마라에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탄타''를 저술했다. 이 책은 기존 브라마팍샤 학파의 ''시단탄타''를 개정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브라마굽타 자신의 독창적인 내용과 새로운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총 24장 1008개의 아리아 미터 형식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천문학에 관한 내용이지만 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알고리즘 등 수학에 관한 중요한 장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후 브라마굽타는 인도 중부의 주요 천문학 중심지였던 아반티, 즉 우자인으로 이주했다. 우자인은 인도 아대륙 중앙부의 말와 지방 중심부에 위치하며, 빈말은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다. 그는 665년, 67세의 나이에 우자인에서 학생들을 위한 실용 천문학 안내서인 ''칸다카디야카''를 저술했다. 이를 통해 그가 적어도 67세까지는 생존했음을 알 수 있다. 브라마굽타는 668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 장소는 우자인으로 여겨진다.
브라마굽타가 활동했던 시기는 현장이 인도를 여행했던 시기(629년-645년)와 겹친다. 당시 인도는 굽타 왕조가 쇠퇴하고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태였다. 현장의 ''대당서역기'' 권 11에는, 브라마굽타의 고향인 빌라마라(기록상 비라마라(Pi-lo-mo-lo))를 수도로 하는 구절라(Kiu-che-lo)국과 그가 후기에 활동한 우자인(기록상 우자연나(U-she-yen-na))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구절라국은 7세기 바나바타(Bāṇabhaṭṭa)의 운문 ''할샤차리타''에 언급된 구르자라데샤로 해석된다.
2. 2. 활동 시기의 인도
브라마굽타가 활동했던 7세기 초 인도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시기였다. 6세기 무렵까지 힌두스탄 평원을 넓게 지배했던 굽타 왕조는 서쪽에서 온 유목민(비문 등에는 후나(Ḥuna)로 기록됨)의 반복적인 침입으로 쇠퇴하였고, 인도 각지에는 여러 소국들이 들어서 있었다.브라마굽타는 구르자라데샤[7](차우다 왕조 통치자 비야그라무카 치세)의 빌라마라(Bhillamāla, 현재의 빈말)에서 태어났다. 빌라마라는 당시 서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왕국이었던 구르자라데샤의 수도였으며, 현재 인도의 남부 라자스탄 주와 북부 구자라트 주를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이곳은 수학과 천문학 연구의 중요한 중심지이기도 했다. 브라마굽타는 생애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이 시기는 중국의 승려 현장이 인도를 여행했던 시기(629년-645년)와 겹친다. 현장의 여행기 『대당서역기』 권 11에는 브라마굽타의 고향인 빌라마라(기록상 피로모로, Pi-lo-mo-lo)를 수도로 하는 구절라(Kiu-che-lo)국과, 그가 후에 활동했던 우자이니(기록상 우자연나, U-she-yen-na, 현재의 우자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구절라국은 7세기 문인 바나의 작품 『하르샤차리타』(하르샤 왕의 전기)에도 언급되는 구르자라데샤로 여겨진다. 『대당서역기』에 따르면 현장이 방문했을 당시 구절라국은 젊고 현명하며 불교를 깊이 믿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젊은 왕의 선대가 브라마굽타가 『브라마스푸타시단탄타』를 저술할 당시의 통치자였던 비야그라무카(Vyāgrahamukha) 왕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브라마굽타는 말년에 인도 중부의 주요 천문학 중심지였던 아반티, 즉 우자인으로 이주하여 활동했으며, 그곳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3. 구르자라데샤와 우자인
브라마굽타는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598년에 태어났다.[7] 그는 차우다 왕조 통치자 비야그라무카(Vyagrahamukha) 치세에 구르자라데샤의 빌라마라(Bhillamāla, 현대 인도 라자스탄 주 빈말)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슈누굽타(Jishnugupta)였으며, 그는 샤이바 힌두교도였다.[8]빌라마라는 당시 서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왕국이었던 구르자라데샤 (현재 인도의 남부 라자스탄 주와 북부 구자라트 주 포함)의 수도였으며, 수학과 천문학 연구의 중요한 중심지였다. 브라마굽타는 생애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보내며 활동했다. 후대의 주석가 프리투다카 스와민(Pṛthūdaka Svāmin)은 그를 '빈말 출신의 스승'이라는 의미의 ''빌라마라차리아(Bhillamalacharya)''라고 불렀다. 그는 당시 인도 천문학의 4대 주요 학파 중 하나인 ''브라마팍샤(Brahmapaksha)'' 학파의 천문학자가 되었고, 인도 천문학에 관한 다섯 가지 전통적인 ''시단탄타''와 아리아바타 1세, 바라하미히라 등 다른 천문학자들의 저술을 깊이 연구했다.
628년, 30세의 나이에 브라마굽타는 ''브라마스푸타시단탄타''('브라마의 개정된 논문')를 저술했다. 이 책은 기존 브라마팍샤 학파의 ''시단탄타''를 개정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학자들은 브라마굽타가 상당한 양의 새로운 자료와 독창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고 평가한다. 총 24장, 1008개의 아리아 미터 형식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천문학을 다루지만 대수학, 기하학, 삼각법, 알고리즘 등 수학에 관한 중요한 장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후 브라마굽타는 인도 중부의 주요 천문학 중심지였던 아반티, 즉 우자인으로 이주했다. 665년, 67세의 나이에 그는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천문학 안내서인 ''칸다카디야카''를 저술했다. 브라마굽타는 665년 이후, 668년경에 우자인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마굽타가 활동했던 시기는 현장이 인도를 여행했던 시기(629년-645년)와 일치한다. 당시 인도는 6세기경 굽타 왕조가 쇠퇴한 후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현장의 여행기인 『대당서역기』 권 11에는 브라마굽타가 활동했던 빈말(기록상 비라마라)을 수도로 하는 구절라국과 우자인(기록상 우자연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는 브라마굽타가 활동했던 지역의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3. 주요 저서
브라마굽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저서를 남겼다.
3. 1. 브라마스푸타시단타 (Brāhmasphuṭasiddhā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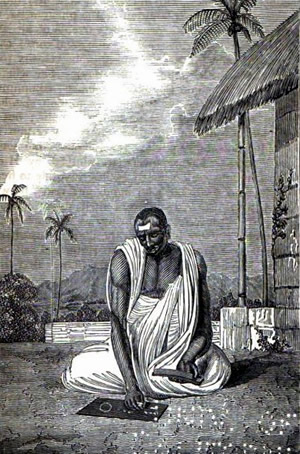
브라마굽타는 628년에 종합적인 수리천문학 서적인 '''브라마스푸타시단타'''(ब्राह्मस्फुटसिद्धान्त|브라흐마스푸타싯단타sa)를 저술했다.[9] 이 책은 여러 장에 걸쳐 수학을 다루고 있는데, 제12장은 가니타(산술)에, 제18장은 꾸따까(대수)에 해당한다. '꾸따까'라는 단어는 원래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였으나, 이후 계수의 값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었고, 대수학에서는 부정방정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브라마스푸타시단타』에서는 0과 음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그 계산법은 현대 수학과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0을 0으로 나누는 것을 0으로 정의한 점(0 ÷ 0 = 0)은 현대 수학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브라마굽타의 문제라고 불리는 이차 부정방정식 (x² − 92y² = 1)의 최소 정수해 (x = 1151, y = 120)를 제시하기도 했다.
3. 2. 칸다카디야카 (Khandakhadyaka)
칸다카디야카는 브라마굽타가 665년에 완성한 천문학 서적이다.[9] 이 책에서 그는 삼각법을 바라하미히라 시대보다 더 발전시켰다.4. 수학적 업적
브라마굽타는 628년에 종합적인 수리천문학 서적인 『브라마스푸타시단타』(Brāhmasphuṭasiddhānta|브라마스푸타시단타sa)를 저술했다. 이 책의 여러 장에서 수학이 다루어지는데, 제12장은 가니타(산술), 제18장은 꾸따까(대수)에 해당한다. '꾸따까'는 원래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였으나, 나중에는 대수학에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0과 음수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계산법을 제시했는데, 이는 현대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단, 0 ÷ 0 = 0으로 정의한 점은 다르다). 또한, 브라마굽타의 문제라고 불리는 이차 부정방정식(''x''2 − 92''y''2 = 1)의 최소 정수해(''x'' = 1151, ''y'' = 120)도 이 책에서 제시되었다.
이후 665년에는 천문학 서적인 『칸다카디야카』(Khaṇḍakhādyaka|칸다카디야카sa)를 저술하여 삼각법 분야를 바라하미히라 시대보다 더 발전시켰다.
브라마굽타는 여러 중요한 수학적 발견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브라마굽타의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헤론의 공식을 포함하는 일반화된 형태로, 코사인 법칙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계와 유사하다.
또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관한 브라마굽타의 정리도 중요한 업적이다. 이 정리는 대각선이 직교하는 원 내접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에서 한 변에 내린 수선의 연장선이 마주보는 변을 이등분한다는 내용이다.
대수학 분야에서는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을 발견했다. 이는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두 수의 곱 역시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항등식이다:
(''a''2 + ''b''2)(''c''2 + ''d''2) = (''ac'' − ''bd'')2 + (''ad'' + ''bc'')2.
이 항등식은 후에 피보나치에 의해서도 제시되어 피보나치의 이중 제곱 항등식으로도 불리며, 3세기 디오판토스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항등식은 이후 오일러의 사중 제곱 항등식과 데갱의 팔중 제곱 항등식으로 확장되었다.
4. 1. 대수학
628년에 저술한 종합적인 수리천문학 서적 『브라마스푸타시단타』(Brāhmasphuṭasiddhānta)는 여러 장에 걸쳐 수학을 다루고 있다. 제12장은 가니타(산술), 제18장은 꾸따까(대수)에 해당한다. '꾸따까'는 원래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였으나, 나중에는 계수의 값을 작게 만드는 점진적 과정, 즉 대수학에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지칭하게 되었다.브라마굽타는 이 책에서 일차 방정식, 이차 방정식, 그리고 여러 미지수를 포함하는 연립 방정식의 해법을 다루었다. 특히 연립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 "술어법(pulverizer)"이라 불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또한 독자적인 축약 기호를 사용하여 대수 문제를 표현했는데, 이는 디오판토스의 대수와 유사하게 축약된 형태였으나 표기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덧셈은 숫자를 나란히 놓아 나타냈고, 뺄셈은 빼는 수 위에 점을 찍었으며, 나눗셈은 나누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 아래에 배치하는 방식(현대의 분수 표기와 유사하나 가로 막대는 없음)을 사용했다. 곱셈, 거듭제곱, 미지수는 해당 용어의 약자로 표기했다. 이러한 축약 기호가 그리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리스와 인도의 축약 기호 모두 공통된 바빌로니아 출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브라마스푸타시단타』에서는 브라마굽타의 문제라고 불리는 이차부정방정식 ''x''2 − 92''y''2 = 1의 최소 정수해(''x'' = 1151, ''y'' = 120)도 제시하고 있다.
『브라마스푸타시단타』 12장에서는 피타고라스 수를 생성하는 데 유용한 공식을 제시한다.[21] 이는 기하학적 문제를 통해 유도된 것으로, 유리수 계수를 갖는 피타고라스 수를 체계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21]
또한 브라마굽타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브라마굽타의 공식을 발견했다. 이 공식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헤론의 공식을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브라마굽타의 정리이다. 이 정리는 원에 내접하면서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그는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두 수의 곱 역시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도 발견했으며, 이는 대수학과 정수론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이다.
4. 1. 1. 일차 방정식과 이차 방정식
브라마굽타는 그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타』(Brāhmasphuṭasiddhānta) 18장에서 일반적인 일차 방정식의 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형태의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rupas'는 상수 와 를 의미한다. 그가 제시한 해는 와 같다.또한, 브라마굽타는 일반적인 이차 방정식에 대해 두 가지 동등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형태의 방정식에 대한 해이며, 다음과 같다.
:
그리고
:
그는 여러 미지수를 포함하는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한 방법도 기술했다. 원하는 변수를 먼저 분리한 다음, 그 변수의 계수로 방정식을 나누는 방식이다. 특히, 그는 여러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풀 때 "술어법(pulverizer)"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디오판토스의 대수와 마찬가지로 브라마굽타의 대수학은 축약된 기호를 사용했다. 덧셈은 숫자를 나란히 놓아 표시했고, 뺄셈은 빼는 수 위에 점을 찍어 나타냈다. 나눗셈은 나누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 아래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현대의 분수 표기와 유사하지만 가로 막대는 없었다. 곱셈, 거듭제곱, 미지수는 해당 용어의 약자로 나타냈다. 이러한 축약 기호가 그리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리스와 인도의 축약 기호 모두 공통된 바빌로니아의 원천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4. 1. 2. 부정 방정식 (디오판토스 방정식)
브라마굽타는 그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타』(Brāhmasphuṭasiddhānta) 18장에서 일반적인 일차 방정식의 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형태의 방정식에 대한 해를 로 제시했는데, 여기서 'rupas'는 상수 와 를 의미한다.또한, 일반적인 이차 방정식 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동등한 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러 미지수를 포함하는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변수를 분리한 다음 그 변수의 계수로 방정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 "술어법(pulverizer)"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브라마스푸타시단타』의 제18장 제목인 '꾸따까(kuṭṭaka)'는 원래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였으나, 점차 계수의 값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었고, 대수학에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브라마굽타의 문제라고 불리는 이차 부정방정식 의 최소 정수해()도 제시하고 있다.
디오판토스의 대수학처럼 브라마굽타의 대수학도 축약된 기호를 사용하였다. 덧셈은 숫자를 나란히 놓는 것으로, 뺄셈은 빼는 수 위에 점을 찍는 것으로, 나눗셈은 나누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 아래에 배치하는 방식(현대의 분수 표기와 유사하나 가로 막대는 없음)으로 나타냈다. 곱셈, 거듭제곱, 미지수는 해당 용어의 약자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축약 기호가 그리스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리스와 인도의 축약 기호 모두 공통된 바빌로니아 출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도 있다.
4. 1. 3.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은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두 수의 곱 역시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항등식이다.[23]:
이 항등식은 피보나치가 그의 저서에 기록하여 피보나치의 이중 제곱 항등식이라고도 불린다. 3세기 디오판토스 역시 이 항등식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은 이후 오일러의 사중 제곱 항등식과 데갱의 팔중 제곱 항등식으로 확장되었다.
4. 2. 산술
브라마굽타 이전에도 여러 문화권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네 가지 기본 연산을 알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힌두-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술 시스템은 브라마굽타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Brāhmasphuṭasiddhānta)』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등장한다. 브라마굽타는 곱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곱하는 수는 소의 밧줄처럼, 곱할 수에 있는 정수 부분만큼 반복되고, 반복하여 곱해진 곱들이 더해진다. 이것이 곱셈이다. 또는 곱하는 수는 곱할 수에 있는 구성 요소만큼 반복된다.[14]
중세 유럽에서는 이러한 인도의 산술 방식을 "modus Indorum|모두스 인도룸la"이라고 불렀다.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에는 현재의 곱셈 방식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gomūtrikā|고무트리카sa"를 포함하여 네 가지 곱셈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15]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의 제12장 "계산"(산술)에서는 분수 연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룬다. 브라마굽타는 독자들이 제곱근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 기본적인 산술 연산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했지만, 정수의 세제곱과 세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나아가 제곱과 제곱근 계산을 쉽게 하는 규칙들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다섯 가지 유형의 분수 조합에 대한 규칙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a''/''c'' + ''b''/''c'', ''a''/''c'' × ''b''/''d'', ''a''/1 + ''b''/''d'', ''a''/''c'' + ''b''/''d'' × ''a''/''c'' = ''a''(''d'' + ''b'')/''cd'', 그리고 ''a''/''c'' − ''b''/''d'' × ''a''/''c'' = ''a''(''d'' − ''b'')/''cd'' 와 같은 연산 규칙을 다루었다.[16]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는 0과 음수의 연산 규칙을 다룬 것으로도 유명하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제18장에서는 꾸따까(대수)를 다룬다.
4. 2. 1. 0과 음수의 정의 및 연산
브라마굽타의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Brāhmasphuṭasiddhānta)』는 0과 음수에 대한 산술 연산 규칙을 제시한 최초의 책이다.[19]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는 바빌로니아인들이 다른 수를 나타내는 자릿수 표기법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단순히 자릿수를 나타내는 기호로서가 아니라, 혹은 프톨레마이오스나 고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양의 부재를 나타내는 기호로서가 아니라, 0을 독립적인 수로 다룬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문헌이다.브라마굽타는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 18장에서 음수에 대한 연산을 설명한다. 그는 먼저 덧셈과 뺄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30. 두 양수의 합은 양수이고, 두 음수의 합은 음수이다; 양수와 음수의 합은 그 차이고, 만약 같다면 0이다. 음수와 0의 합은 음수이고, 양수와 0의 합은 양수이며, 두 0의 합은 0이다.
[...]
18.32. 음수에서 0을 빼면 음수이고, 양수에서 0을 빼면 양수이다; 0에서 0을 빼면 0이다. 음수에서 양수를 빼거나 양수에서 음수를 빼려면 더해야 한다.[12]
이어서 곱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8.33. 음수와 양수의 곱은 음수이고, 두 음수의 곱은 양수이며, 양수의 곱은 양수이다; 0과 음수의 곱, 0과 양수의 곱, 또는 두 0의 곱은 0이다.[12]
하지만 그가 설명하는 0으로 나누기는 현대적인 이해와 다르다.
18.34. 양수를 양수로 나누거나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양수이고; 0을 0으로 나누면 0이고;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이고; 음수를 양수로 나누면 [역시] 음수이다.
18.35. 음수 또는 양수를 0으로 나누면 그 [0]이 제수가 되고, 0을 음수 또는 양수로 나누면 [그 음수 또는 양수가 제수가 된다]. 음수 또는 양수의 제곱은 양수이고; 0의 제곱은 0이다. 제곱의 제곱근은 [그것]의 제곱근이다.[12]
여기서 브라마굽타는 0/0 = 0이라고 명시하고, 0이 아닌 수 a에 대해 a/0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20] 그의 음수와 0에 대한 산술 규칙은 현대적인 이해와 매우 유사하지만, 현대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기를 정의되지 않음으로 남겨두는 점이 다르다.
4. 2. 2. 제곱과 세제곱의 합 공식
브라마굽타는 그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에서 처음 ''n''개 정수의 제곱의 합과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제시했다.12.20. 제곱의 합은 [합]에 두 배의 [개수] 단계를 더하고 1을 더한 후 3으로 나눈 값이다. 세제곱의 합은 그 [합]의 제곱이다.[17]
여기서 브라마굽타는 결과를 현대적인 방식처럼 ''n''에 대한 식으로 직접 나타내기보다는, 처음 ''n''개 정수의 '합'을 이용하여 표현했다.[18]
그가 제시한 공식은 현대 수학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처음 ''n''개 자연수의 제곱의 합: ''n''(''n'' + 1)(2''n'' + 1) / 6
- 처음 ''n''개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n''(''n'' + 1) / 2)2
4. 3. 기하학
브라마굽타는 그의 저서 상당 부분을 기하학에 할애했다. 그는 삼각형의 밑변이 높이에 의해 나누어지는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12.22. 밑변에서 변의 제곱의 차를 밑변으로 나눈 값을 빼고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참된 선분이 된다. 수선(높이)는 한 변의 제곱에서 그 선분의 제곱을 뺀 값의 제곱근이다.[17]
이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높이와, 높이에 의해 밑변이 나뉘는 두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선분의 길이는 (밑변 ± (다른 두 변의 제곱의 차 / 밑변)) / 2 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밑변은 ''b'', 다른 두 변은 ''a'', ''c''이다.)
또한 유리수 삼각형(변의 길이와 넓이가 모두 유리수인 삼각형)에 대한 정리도 제시했다. 이러한 삼각형의 세 변 ''a'', ''b'', ''c''는 임의의 유리수 ''u'', ''v'', ''w''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25]
: a = (u2/v + v) / 2, b = (u2/w + w) / 2, c = (u2/v - v + u2/w - w) / 2
브라마굽타는 직각삼각형을 기본으로 하여 이등변삼각형, 부등변삼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이등변사다리꼴 포함), 순환사각형 등 다양한 도형을 작도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π(원주율)의 값을 제시한 후에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기하학을 다루며, 직육면체, 피라미드, 정사각뿔대의 부피와 표면적(또는 고체에서 파낸 빈 공간)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다.[26] 특히 피라미드의 뿔대 부피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값과 "표면적인" 값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26]
그의 기하학 연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브라마굽타의 공식과, 대각선이 직교하는 원 내접 사각형의 성질에 관한 브라마굽타의 정리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그의 가장 유명한 기하학적 업적으로 꼽힌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참조)
또한,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두 수의 곱 역시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도 발견했다.
: (a2 + b2)(c2 + d2) = (ac − bd)2 + (ad + bc)2 = (ac + bd)2 + (ad - bc)2
이 항등식은 후대에 피보나치에 의해서도 제시되어 피보나치의 이중 제곱 항등식이라고도 불리며, 3세기 디오판토스 역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항등식은 이후 오일러의 사중 제곱 항등식과 데갱의 팔중 제곱 항등식으로 확장되었다.
더불어 브라마굽타는 665년에 저술한 천문학 서적 『칸다카디야카』(Khandakadyaka)에서 삼각법을 바라하미히라 시대보다 더 발전시키기도 했다.
4. 3. 1. 브라마굽타의 공식
브라마굽타의 기하학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업적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브라마굽타의 공식이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브라마굽타는 그 넓이를 구하는 근사 공식과 정확한 공식을 제시했다.
12.21. 근사값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변과 마주보는 변의 합의 절반의 곱이다. 정확한 [넓이]는 사각형의 각 변을 [각각] 뺀 변의 합의 절반의 곱의 제곱근이다.[17]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를 각각 ''p'', ''q'', ''r'', ''s''라고 할 때, 넓이의 근사값은 이다.
사각형의 반둘레를 ''t'' = 라고 하면, 정확한 넓이는 다음과 같다.
:
브라마굽타는 이 공식이 적용되는 사각형이 반드시 원에 내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식 자체의 형태로 볼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것임이 분명하다.[24] 헤론의 공식은 브라마굽타 공식의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0으로 가정하면 헤론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
4. 3. 2. 브라마굽타의 정리
브라마굽타는 기하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이름이 붙은 여러 정리 중 브라마굽타의 정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관한 것이다.이 정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직교할 때), 대각선의 교점에서 사각형의 한 변에 내린 수선의 연장선은 그 변과 마주보는 변(대변)을 이등분한다는 내용이다.[17] 즉, 그림에서 대각선 AC와 BD가 점 M에서 수직으로 만나고, M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할 때, 직선 ME를 연장하여 변 AD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면, 점 F는 변 AD의 중점이 되어 ''AF'' = ''FD''가 성립한다.
4. 4. 삼각법
브라마굽타는 665년에 천문학 서적인 『칸다카디야카』(Khaṇḍakhādyaka|칸다카디야카sa)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그는 바라하미히라 시대보다 더 발전된 삼각법 이론을 제시하였다.4. 4. 1. 사인표
브라마굽타는 그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타』(Brāhmasphuṭasiddhānta|브라마스푸타시단타sa) 2장 "행성의 진정한 경도(Planetary True Longitudes)"에서 다음과 같은 사인표를 제시한다.2.2–5. 사인값들: 조상들, 쌍둥이들; 큰곰자리, 쌍둥이들, 베다; 신들, 불들, 여섯; 맛들, 주사위, 신들; 달, 다섯, 하늘, 달; 달, 화살들, 태양들 [...][27]
여기서 브라마굽타는 산스크리트 논문에서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자릿값 기수법의 자릿수를 나타내는 데 사물의 이름을 사용한다. "조상들"은 인도 우주론에서 14명의 조상("마누")을 나타내므로 14를 의미하고, "쌍둥이들"은 2를, "큰곰자리"는 큰곰자리의 일곱 별을 나타내므로 7을, "베다"는 4개의 베다를 의미하므로 4를, "주사위"는 전통적인 주사위의 면의 수를 나타내므로 6을 의미하는 식이다. 이 정보는 사인값 목록 214, 427, 638, 846, 1051, 1251, 1446, 1635, 1817, 1991, 2156, 2312, 2459, 2594, 2719, 2832, 2933, 3021, 3096, 3159, 3207, 3242, 3263, 3270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반지름은 3270이다 (이 숫자들은 에 대해 을 나타낸다).[28]
4. 4. 2. 보간법
665년 브라마굽타는 이미 표로 만들어진 값들로부터 보간을 통해 삼각함수의 사인 값을 새롭게 구하기 위해, 2차 뉴턴-스터링 보간 공식의 특수한 경우를 고안하여 사용했다.[29] 이 공식은 함수 ''f''의 값이 세 지점, 즉 ''a'' − ''h'', ''a'', ''a'' + ''h''에서 이미 알려져 있을 때, ''a'' + ''xh'' (여기서 ''h'' > 0 이고 −1 ≤ ''x'' ≤ 1)에서의 함수 값 ''f''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추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Δ는 1차 전향 차분 연산자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5. 천문학적 업적
브라마굽타는 경쟁 천문학자들의 업적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그의 대표 저서인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Brāhmasphuṭasiddhānta)는 인도 수학자들 사이의 초기 견해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수학 자체보다는 수학을 물리적 세계, 특히 천문학에 적용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브라마굽타는 주로 천문학적 매개변수와 이론의 선택에 있어 다른 학자들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32] 그는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의 처음 열 개 장에 걸쳐 경쟁 이론들을 비판했으며, 특히 11장은 전적으로 이러한 비판에 할애되었다. 다만 12장과 18장에는 비판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32]
『브라마스푸타시다탄타』의 제7장 "달의 초승달"에서는 달이 태양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당시의 일부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태양이 달을 비추는 원리를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34]
1. 만약 달이 태양 위에 있다면, 달의 경도 계산으로부터 삭망(syzygy) 등의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달의 가까운 절반은 항상 밝을 것이다.
2. 햇빛 아래 서 있는 항아리의 태양을 향한 면이 밝고 반대쪽 면이 어두운 것처럼, 달이 태양 아래에 있다면 달의 밝고 어두움도 이와 같을 것이다.
3. 밝기는 태양 방향으로 증가한다. 차오르는 반달의 끝에서는 가까운 절반이 밝고 먼 절반은 어둡다. 따라서 초승달 뿔의 높이는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다. [...][33]
브라마굽타는 달이 태양보다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달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의 정도는 태양과 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천체 사이의 각도 크기를 계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34]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칸다카디야카』(Khandakhadyaka)에서는 행성의 경도, 일주 운동, 월식과 일식, 천체의 출몰, 달의 위상 변화, 행성의 합 등 더 상세한 천문학적 주제들을 다루었다.
5. 1. 중력 개념
브라마굽타는 628년에 처음으로 중력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묘사하며, 이를 "गुरुत्वाकर्षणम्|구루트바카르샤남sa"(gurutvākarṣaṇam)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1][2][3][4]: 지구는 사방이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바로 서 있고, 모든 무거운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구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본성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사물을 끌어당기고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지구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시도해 보게 하십시오. 지구는 유일하게 '낮은' 곳이며, 씨앗은 어느 방향으로 던져도 항상 지구로 돌아오고, 지구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30][31]이 인용문의 출처는 알비루니의 "인도"(약 1030년)이다.
6. 영향과 평가
브라마굽타의 수학적, 천문학적 업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도 내에서는 그의 직계 후손인 바스카라 2세가 브라마굽타를 "가나카-차크라-추다마니"(수학자들의 원형의 보석)라 칭하며 그의 이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프리투다카 스와민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브라마굽타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타』와 『칸다카디야카』에 주석을 달아 내용을 해설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주석 작업은 12세기까지 이어졌다.
브라마굽타의 영향력은 인도 아대륙을 넘어 아랍 세계까지 확장되었다. 8세기 압바스 왕조 시대에 그의 저술이 아랍어로 번역되면서, 그가 사용한 인도 십진법과 계산법(알고리즘)이 아랍 세계에 소개되었다. 이는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 등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어 현대 수학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10][11]
그의 저서 『브라마스푸타시단타』는 0과 음수의 연산 규칙을 제시하고, 대수학적 문제 해결 방법(꾸따까)을 다루었으며, 이차 부정방정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시대를 앞서나간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 공식, 대각선이 직교하는 내접사각형의 성질,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 등 기하학과 수론 분야에서도 중요한 발견을 남겼다. 이러한 업적들은 후대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이름은 여러 공식과 정리에 남아 기려지고 있다. 과학사가 조지 사르톤은 그를 "그의 민족 중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그의 시대 최고의 과학자"라고 평가했다.
6. 1. 아랍 세계로의 전파
브라마굽타 사후 수십 년이 지난 712년, 신드 지역은 아랍 칼리파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아랍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압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만수르(재위 754년–775년) 시대에 신드에서 온 사절단이 바그다드의 궁정을 방문했다. 이 사절단에는 카나카라는 이름의 점성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브라마굽타의 저술을 포함한 인도의 천문학 지식을 (아마도 암기하여) 가져왔다.알-만수르 궁정의 천문학자였던 무함마드 이븐 이브라힘 알-파자리는 브라마굽타의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하여 『신드힌드』(Zīj al-Sindhind)와 『아라칸드』(Arkand)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 번역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브라마굽타의 저술에 사용된 인도 십진법이 아랍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수학자 알콰리즈미(약 800년–850년)는 인도 수학에 기반하여 「알-잠 와 알-타프리크 비 히삽 알-힌드」(Kitāb al-Jamʿ wa-l-tafrīq bi-ḥisāb al-Hind, 인도 숫자를 사용한 계산법)라는 중요한 저서를 저술했다. 이 책은 13세기에 라틴어로 『알고리트미 데 누메로 인도룸』(Algoritmi de numero Indorum, 인도 숫자에 관한 알고리즘)으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본들을 통해 십진법과 브라마굽타의 산술 알고리즘이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알콰리즈미는 또한 알-파자리의 번역본을 바탕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 이론을 일부 통합하여 자신만의 『신드힌드』 판본을 저술하기도 했다. 인도의 천문학 지식은 이후 수 세기 동안 널리 유포되어 중세 유럽의 라틴어 문헌에도 영향을 미쳤다.[10][11]
6. 2. 한국 수학사에서의 의의
(내용 없음 -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브라마굽타'가 '한국 수학사'에 미친 영향이나 의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6. 3. 현대적 평가
브라마굽타의 수학적 업적은 후대의 인도 수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자인의 직계 후손인 바스카라 2세는 브라마굽타를 "가나카-차크라-추다마니"(수학자들의 원형의 보석)라고 칭송하며 그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프리투다카 스와민은 브라마굽타의 주요 저작인 『브라마스푸타시단타』와 『칸다카디야카』 모두에 주석을 달아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고 그림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8세기와 9세기에는 랄라와 바토트팔라가 『칸다-카디야카』에 대한 주석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러한 주석 작업은 12세기까지 계속되었다.[10][11]브라마굽타 사후, 그의 수학적 성과는 아랍 세계로 전파되어 큰 영향을 주었다. 712년 신드 지역이 아랍 칼리파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인도와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압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만수르(재위 754–775) 시대에 신드에서 온 사절단이 브라마굽타의 저술을 포함한 인도의 천문학 지식을 가져왔다. 이 지식은 알-만수르 궁정의 천문학자 무함마드 이븐 이브라힘 알-파자리에 의해 『신드힌드』(Sindhind)와 『아라칸드』(Arkand)라는 제목으로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을 통해 브라마굽타가 사용한 십진법 체계가 아랍 세계에 소개되었고, 이는 이후 수학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페르시아의 수학자 알콰리즈미(약 800–850)는 브라마굽타의 산술을 바탕으로 「알-잠 왈-타프리크 비 히살-알-힌드」(인도 산술에서의 덧셈과 뺄셈)를 저술했으며, 이 책은 13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알고리트미 데 누메로 인도룸』(Algoritmi de numero Indorum)이라는 제목으로 유럽에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십진법과 브라마굽타의 계산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알콰리즈미는 또한 알-파자리의 번역본을 기반으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통합하여 자신만의 『신드힌드』 판본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인도의 천문학 및 수학 지식은 수 세기 동안 널리 유포되어 중세 라틴 문헌에도 영향을 미쳤다.[10][11]
과학사가 조지 사르톤은 브라마굽타를 "그의 민족 중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자 그의 시대 최고의 과학자"라고 평가하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라마굽타의 대표적인 업적은 다음과 같다.
- 『브라마스푸타시단타』(ब्राह्मस्फुटसिद्धान्त|Brāhmasphuṭasiddhāntasa, 628년): 천문학과 수학을 아우르는 종합 서적으로, 제12장(가니타, 산술)과 제18장(꾸따까, 대수)에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꾸따까'는 원래 '가루로 만들다'는 뜻이었으나, 점차 계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어 대수학에서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지칭하게 되었다.
- 0과 음수의 도입: 이 책에서 0과 음수의 개념을 명확히 다루고 그 연산 규칙을 제시했다. 이는 현대 수학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지만, 0을 0으로 나누는 것을 0으로 정의한 점은 현대 수학과 다르다.
- 브라마굽타의 문제: 『브라마스푸타시단타』에서 이차 부정방정식 ''x''² − 92''y''² = 1의 해법을 제시하고 최소 정수해 (''x'' = 1151, ''y'' = 120)를 구했다. 이는 이후 펠 방정식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 『칸다카디야카』(खण्डखाद्यक|Khaṇḍakhādyakasa, 665년): 천문학 서적으로, 바라하미히라 시대보다 진일보한 삼각법 이론을 담고 있다.
- 브라마굽타의 공식: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헤론의 공식을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코사인 법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포함하는 관계와 유사하다.
- 브라마굽타의 정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중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는 경우, 대각선의 교점에서 한 변에 내린 수선의 연장선은 마주보는 변을 이등분한다는 정리이다.
- 브라마굽타의 이중 제곱 항등식: 두 개의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두 수의 곱 역시 두 제곱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항등식이다: (''a''² + ''b''²)(''c''² + ''d''²) = (''ac'' − ''bd'')² + (''ad'' + ''bc'')² = (''ac'' + ''bd'')² + (''ad'' − ''bc'')². 이 항등식은 후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에 의해 재발견되어 피보나치의 이중 제곱 항등식으로도 불리며,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디오판토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항등식은 이후 오일러의 사중 제곱 항등식과 데갱의 팔중 제곱 항등식으로 확장되었다.
참조
[1]
서적
Archimedes to Hawking: Laws of Science and the Great Minds Behind Them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
서적
Late classical India
https://books.google[...]
A. Mukherjee & Co.
1988
[3]
서적
The Argumentative Indian
Allen Lane
2005
[4]
서적
Early Astronomy
Springer-Verlag
[5]
서적
The Birth of Mathematics: Ancient Times to 1300
Infobase Publishing
[6]
서적
The Universe in Zero Words: The Story of Mathematics as Told through Equations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7]
서적
Alberuni's India, Volume I
https://archive.org/[...]
Kegan Paul, Trench and Trubner
[8]
서적
[9]
서적
Pingree's Census of the Exact Sciences in Sanskrit
http://archive.org/d[...]
APS
[10]
서적
Religion, Learning and Science in the 'Abbasid Period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11-02
[11]
서적
Islamic Cultures, Islamic Contexts: Essays in Honor of Professor Patricia Crone
BRILL
2014-11-28
[12]
서적
[13]
서적
[14]
서적
Algebra, with Arithmetic and Mensuration, from the Sanscrit of Brahmegupta and Bháscara
https://books.google[...]
John Murray
[15]
서적
Mathematics in History, Culture, Philosophy, and Science: From Ancient Times to Modern Age
https://books.google[...]
Mittal Publications
[16]
서적
[17]
서적
[18]
서적
[19]
서적
The Nothing That Is: A Natural History of Zero
Allen Lane/The Penguin Press
[20]
서적
[21]
서적
[22]
서적
[23]
서적
[24]
서적
[25]
서적
[26]
서적
[27]
서적
[28]
서적
[29]
서적
[30]
서적
Alberuni's India
http://www.columbia.[...]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 Co., 1910. Electronic reproduction. Vol. 1 and 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2006
2014-06-03
[31]
서적
Kitāb al-Jawharatayn al-'atīqatayn al-mā'i'atayn min al-ṣafrā' wa-al-bayḍā': al-dhahab wa-al-fiḍḍah
Maṭba'at Dār al-Kutub wa-al-Wathā'iq al-Qawmīyah bi-al-Qāhirah
2004
[32]
서적
[33]
서적
[34]
서적
[35]
이미지
Dybuck or Astronomer. – Solvyn, Les Hindous
http://www.lookandle[...]
[36]
웹사이트
Daybuc. Astronomer by Balthazar Solvyns published Paris, 1808
http://www.grosvenor[...]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