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1435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이수형(1435년)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김담의 문인이자 사위였다. 17세에 관직에 나아가 선교랑, 전생서령 등을 지냈으나, 1455년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이후 단종을 추모하며 은거 생활을 했으며, 세조가 여러 번 벼슬을 내렸지만 거절했다. 그는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키며 70년 동안 한성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94세에 생을 마감했다. 저서로는 《도촌선생실기》와 《괴단감광록》이 있다. 사후 동학사에 배향되었으며, 증 통정대부, 가선대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435년 출생 - 시바 요시타케
시바 요시타케는 2세에 가문을 계승하여 숙부들의 후견을 받았고, 영지 문제와 암살 미수 사건을 겪었으며, 아시카가 요시마사에게 이름자를 받아 개명했지만, 18세에 후계자 없이 사망하여 시바 씨 적류를 단절시켰다. - 1435년 출생 - 영해군 (왕족)
세종과 신빈 김씨의 다섯째 아들인 영해군은 1442년 영해군에 봉해졌고 임천군부인 평산 신씨와 혼인하여 영춘군 이인, 길안도정 이의, 박승약에게 시집간 딸을 두었으며 시호는 안도이다. - 은자 - 생육신
생육신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며 절개를 지킨 김시습, 성담수, 원호, 이맹전, 조려, 남효온 등 여섯 명의 은둔 신하를 지칭하며, 이들은 단종 복위 운동 실패 후 관직에 나아가지 않거나 은둔하며 저항했고 사림 세력에 의해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 은자 - 피에르 레르미트
피에르 레르미트는 11세기 말 제1차 십자군 당시 빈민 십자군을 이끈 프랑스 은둔자이자 설교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장 순례를 주도하며 민중을 이끌었으나 군사적 실패 후 제후 십자군에 합류하여 사기를 고무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대중문화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 1528년 사망 - 조반니 다 베라차노
조반니 다 베라차노는 16세기 이탈리아 탐험가이자 항해사로 프랑수아 1세의 지원을 받아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탐험하며 뉴욕 만을 포함한 지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유럽 지도 제작에 기여했으나, 태평양 항로를 찾던 중 1528년 카리브해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1528년 사망 - 패트릭 해밀턴
패트릭 해밀턴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로, 루터의 사상을 접하고 교회 개혁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했으며,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에 영향을 미쳤다.
2. 생애
젊은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으나, 1455년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이에 분개하여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다.[1] 이후 1457년 단종이 죽임을 당하자 3년간 상복을 입고 애도했으며, 평생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단종을 추모하며 70여 년간 은둔 생활을 하였다.[1][2]
2. 1. 생애 초기
도촌 이수형은 1435년(세종 18년) 한성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군자감 주부를 지낸 이경창(李景昌)이며, 고조부 이억(李嶷)은 고려 말 문신으로 1388년 요동 정벌에 참여했으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1392년 조선을 건국하자 이를 비판하며 개국공신과 관직을 거부하고 순흥 소백산으로 낙향하여 절의를 지켰다.[6] 증조부 이만(李滿)은 고려 말 중추원부사를 지냈으나 조선 건국 후 호분위 경력으로 강등되었고, 할아버지 이인숙(李仁淑)은 지덕천군사[7]와 판사복시사를 역임했다. 어머니는 예문관 직제학을 지내고 증 의정부 좌참찬에 추증된 안구(安玖)의 딸이자 안지귀의 누이였다. 형제로는 형 이말형과 직강 정이득에게 출가한 누이가 있었다. 자(字)는 영보(英甫), 호는 도촌(桃村)이며, 공북헌(拱北軒)과 도은(桃隱)이라는 별호도 사용했다.[6]그는 문절공 김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이후 김담의 맏딸과 혼인하여 그의 맏사위가 되었다.
1450년, 17세의 나이에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아가 선교랑 전생서령(宣敎郞 典牲暑令)을 시작으로 부사직 등을 거쳐 조봉대부 행평시서령(朝奉大夫 行平市署令)에 이르렀다. 그러나 1455년(단종 3년), 숙부인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이에 크게 분개하여 21세의 나이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였다.[9][1]
낙향 후 이수형은 유배지인 청령포를 찾아가 단종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으며, 원호(元昊), 조려(趙旅) 등 생육신들과 함께 영월 수주면의 무릉계곡(武陵溪谷)에서 자주 만나 시국을 논하며 단종의 안위를 걱정했다.[10] 1456년 3월 16일(음력 3월 기망), 원주 치악산에 올라 단종에 대한 충절과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맹세하고 바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고 내려왔다.[9][10]
1457년, 단종이 결국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이수형은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단종을 애도했다. 이후 그는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에 은거하며 70여 년간 은둔 생활을 하였다.[1][2]
2. 2. 세조 찬위와 은거
김담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그의 딸과 혼인하였다. 1450년(세종 32년) 17세의 나이로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선교랑, 전생서령, 부사직 등을 지냈다.1455년(단종 3년)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이에 분개하여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였다.[1] 처가가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의 도지리(道知里, 현재의 도촌리)로 낙향하여 은거 생활을 시작했다. 세조는 즉위 전부터 교분이 두터웠던 이수형을 여러 차례 불러 관직과 토지를 주며 회유하려 했으나, 이수형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절의를 지키며 끝내 거절하였다.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고 관련자들이 처형당했으며, 순흥부가 현으로 강등되는 정축지변이 일어나자, 이를 피해 잠시 몸을 숨기기도 했다.
1457년(세조 3년) 단종이 영월에서 사사되자[2],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삼년상을 치렀다. 상을 마친 뒤에도 평생 단종을 추모하며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산속에 삼면이 벽으로 막히고 북쪽으로 작은 창을 낸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는 단종의 능인 장릉이 있는 북쪽(영월군)을 향한 것이었다. 훗날 충재 권벌의 6대손인 창설 권두경(權斗經)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수형의 충절에 감탄하며, 단종을 향한 깊은 마음을 기려 방 이름을 '천 길 충절'이라는 의미의 천인실(千仞室)이라 지었다. 또한 눌은 이광정은 두 손을 마주 잡고(공수) 북쪽(단종의 능)을 향해 평생 경모했다는 뜻에서 마루 이름을 공북헌(拱北軒)이라 짓고[11] 행장과 유기를 남겼다. 신야 이인행(李仁行) 역시 공북헌을 찾아 그를 기리며 공북헌중수기(拱北軒重修記)를 남겼다.[12] 동암 권성오(權省吾)는 도촌이선생유사(桃村李先生遺事)를 지어 그의 행적을 기록했다.[13]
그가 은거한 도지리(道知里)는 모래가 많아 사제(沙堤) 마을 또는 사재라고도 불렸으나, 훗날 그의 호인 도촌(桃村)을 따서 도촌리로 불리게 되었다. 공북헌 인근에는 이수형이 직접 지은 정자인 송고정(松皐亭)이 있었으며, 조선 말기 학자 수산 김휘철(金輝轍)이 이곳의 소나무를 기리는 송고정기(松皐亭記)를 남겼다.[14]
2. 3. 은거 생활
1455년,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1], 이수형은 이에 분개하여 선교랑, 전생서령, 부사직 등의 관직을 모두 버리고 은거를 결심했다. 그는 처가가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문단리 근처 도지리 도촌(桃村)으로 낙향하여 숨어 살았다. 세조와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교분이 두터웠기에, 세조는 여러 번 사람을 보내 식량과 토지를 하사하며 관직에 나올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수형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굳은 절의(節義)를 지키며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관련자들이 처형당하자, 순흥부가 현으로 강등되는 등 탄압이 심해지자 이수형 역시 몸을 피해야 했다. 1457년(세조 3) 11월, 단종이 영월에서 사사되자[2], 이수형은 3년상을 치르며 슬퍼했다. 상을 마친 뒤에도 평생 단종을 추모하며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은둔 생활을 이어갔으며, 약 70년 동안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2]
이후 그는 산속 깊이 들어가 삼면이 벽이고 동남쪽에 작은 창만 있으며 북쪽을 향한 집을 짓고 살았다. 북쪽은 단종의 능침인 영월 장릉이 있는 방향으로, 단종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훗날 충재 권벌의 6대손인 권두경(權斗經)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수형의 충절에 감동하여, 단종을 향한 깊은 충심을 기려 방 이름을 '천인실(千仞室)'이라 지었다. 또한 눌은 이광정은 마루 이름을 '공북헌(拱北軒)'이라 명명했는데, 이는 두 손을 맞잡고 평생 단종을 경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11] 이광정은 이수형의 행장과 유기를 남겼으며, 신야 이인행(李仁行) 역시 공북헌을 찾아 그를 추모하며 공북헌중수기(拱北軒重修記)를 남겼다.[12] 동암 권성오(權省吾)는 도촌이선생유사(桃村李先生遺事)를 남겨 그의 삶을 기록했다.[13]
그가 처음 낙향한 곳은 도지리(道知里) 또는 모래가 많아 사제(沙堤) 마을이라 불렸으나, 훗날 그의 호 '도촌'(桃村)을 따서 도촌리로 불리게 되었다. 공북헌 근처에는 그가 지은 정자 송고정(松皐亭)이 있었으며, 조선 말기의 한학자 수산 김휘철(金輝轍)이 소나무의 절개를 이수형의 삶에 빗대어 설명한 송고정기(松皐亭記)를 남겼다.[14] 공북헌에 살 때 이수형은 손수 괴화나무를 심어 시름을 달래고 시를 읊는 낙으로 삼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수형이 세상을 떠나자 그가 심었던 괴화나무도 함께 말라 죽었으나, 1715년 단종이 복위되자 나무도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이 괴화나무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다시 고사했다가 또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진다.
2. 4. 생애 후반
세조는 이후에도 어모장군 충좌위 부사직, 상장(상호군), 호군 등 여러 번 벼슬을 내리며 불렀지만, 이수형은 모두 거절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단종에 대한 충절을 지키며 세조의 회유를 뿌리쳤다.그는 장인인 문절공 김담 외에도 원호(元昊)‚ 조려(趙旅)‚ 송석충(宋碩忠) 등 생육신을 비롯한 절의를 지킨 인물들과 교유하며 시름과 회한을 달랬다. 자신이 은거한 공북헌 옆에는 괴화나무를 직접 심고, 그 주변을 산책하며 시문을 읊기도 했다.
성종 때인 1476년 11월 29일 다시 직위와 작첩이 내려졌으나[15], 이 역시 받지 않고 거절했다. 그는 단종이 폐위되고 죽임을 당한 후 70년 동안 그를 추모하며 한성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학자 성재 권상익(權相翊)은 '보통 사람은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곳에서 선생은 70년을 보냈다. 그러나 선생은 이곳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고 이름을 짓지도 않았다.'라고 그의 굳은 절의를 높이 평가했다.[16]
저서로는 《도촌선생실기》(桃村先生實紀)와 《괴단감광록》(槐壇曠感錄)이 있다. 1528년 1월 4일 도촌 사제동에서 향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3. 사후
묘는 경상도 순흥부 동원면 오상리(현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오상동) 흑석곡에 마련되었다. 그의 아들 이대근은 후에 금성대군 유가 처형된 곳을 찾아 금성단을 수축하였다. 첫 묘비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없으나, 시간이 흘러 묘비가 훼손되자 후손 이휘도가 이광정에게 여러 번 요청하여 1738년(영조 14년) 이광정이 새로 묘갈문을 짓고 이휘도의 동생 이홍도가 새 비석을 세웠다.
후대의 학자 고심당 조정융(趙廷瀜)은 이수형에 대해 ''라고 평하며 그의 고결한 절조를 도연명에 비견하였다.
사후 사림들에 의해 충청도 공주 동학사 숙모전(肅慕殿)에 배향되었다. 또한 1608년(광해군 2년)에는 경상도 순흥 지역 사림들의 공론에 따라 순흥 도계서원에 금성대군 이유, 순흥부사 이보흠 등과 함께 제향되었다. 그러나 도계서원은 흥선대원군 집권기 서원 철폐령에 따라 철폐되어 현재는 건물만 남아 있다.[9] 1731년(영조 7년)에는 영월의 사림들이 창절사(彰節祠)에 추가로 배향할 것을 논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1799년(정조 23년) 영남의 선비들이 간행한 영남인물고의 순흥편에 그의 이름이 수록되었으며, 연경재 성해응(成海應)의 장릉병의제신전(莊陵秉義諸臣傳)에도 그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1858년(철종 9년) 경상도 암행어사였던 학사 임응준(任應準)의 상소로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되었다.[9] 이후 노원 김철수(魯園金喆銖)는 상소 '도촌이공청가증장(桃村李公請加贈狀)'을 올려 이미 증직된 이수형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였다. 상소문에서는 '단종을 위해 절의를 지킨 신하에게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는 것은 이미 나라의 법도이며, 원호, 조려 등 여러 신하들은 진사로서 특별히 이조판서의 증직을 받았으니 이수형에게도 차등이 없어야 한다. 원컨대 천지부모와 같은 임금께서는 은혜로운 예에 따라 특별히 시호를 내려주소서'()라고 하였으며, 이 상소문의 초안은 김철수의 문집 '노원만록(魯園謾錄)' 2권에 실려 있다.
1870년(고종 7년) 12월 24일, 그의 충절을 기리는 고종의 특별 명령으로 다시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추증되었다.[17][9]
4. 저서
- 《도촌선생실기》
- 《괴단감광록》
5. 가족 관계
고려 말 문신이었던 고조부 이억(李嶷)은 1392년 조선 건국 후 순흥 소백산으로 낙향하였다. 증조부 이만(李滿)은 고려 말 중추원부사였으나 조선 건국 후 호분위경력으로 강등되었다. 할아버지 이인숙(李仁淑)은 지덕천군사, 판사복시사를 역임했고, 아버지 이경창(李景昌)은 군자감주부를 지냈다. 어머니는 예문관직제학 안구(安玖)의 딸이자 안지귀의 누이인 순흥 안씨이다. 스승이자 장인인 김담은 이조판서를 지낸 문절공이다.
- 할아버지 : 이인숙(李仁淑, 지덕천군사와 판사복시사 역임)
- 할머니 : 해주 오씨, 지인천군사 증 정헌대부 오부(吳傅)의 딸, 좌의정 경주이씨 이성중의 외손녀
- * 아버지 : 이경창(李景昌, ? ~ ?, 봉렬대부 군자감 주부)
- * 어머니 : 순흥 안씨(順興安氏, 안구(安玖)[18]의 딸, 안지귀의 누이
- ** 부인 : 증 정부인 예안김씨(? ~ 1558년 8월 27일, 문절공 김담의 장녀)
아들 : 이대근(李大根[19], 홍천현감)
며느리 : 안동 권씨, 증판서 권황의 딸, 권벌의 고모
* 손자 : 이양
* 손자 : 이당
* 손자 : 이영(李榮, 1492년 ~ 1583년), 호는 북산(北山), 가선대부 병조참판 지냄
아들 : 이양근, 전설서 별좌 역임
아들 : 이성근, 감역
* 손자 : 이공, 어모장군 행 권관
아들 : 이준근, 참봉
며느리 : 야성 송씨, 눌재 송석충의 딸
* 손자 : 이은, 참봉
* 손녀 : 이씨, 덕수 이씨 이귀의 처
6. 관련 유적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이수형은 처가가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 문단리 근처 도지리 도촌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세조는 즉위 전 이수형과 교분이 두터웠기에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식물과 전답을 하사하며 등용하려 했으나, 그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굳은 절의(節義)로 이를 거절하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하고 관련자들이 처형당했으며 순흥부가 현으로 강등되자, 이수형 역시 몸을 피해야 했다.
1457년(세조 3) 11월 단종이 사사되자, 이수형은 단종의 3년상을 치렀다. 상을 마친 뒤에도 그는 평생 단종을 추모하며 은거 생활을 이어갔다.
이수형은 산속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삼면이 벽으로 막히고 동남쪽으로 작은 창만 낸 채 북쪽을 향하도록 지었다. 북쪽은 단종의 능침인 영월군 장릉이 있는 방향이었다. 훗날 충재 권벌의 6대손인 창설 권두경(權斗經)이 이곳을 방문하여 이수형의 충절에 감동하였다. 그는 단종을 향한 이수형의 깊은 충심을 기려 방 이름을 천인실(千仞室)이라 지었다. 또한 눌은 이광정은 마루를, 두 손을 맞잡고 평생 단종을 경모했다는 의미로 공북헌이라 명명하고[11] 이수형의 행장과 유기를 남겼다. 신야 이인행(新野 李仁行) 역시 공북헌을 찾아 그를 추모하며 공북헌중수기(拱北軒重修記)를 남겼다.[12] 동암 권성오(東巖 權省吾)는 도촌이선생유사(桃村李先生遺事)를 남겼다.[13]
그가 처음 낙향한 곳은 도지리(道知里) 또는 모래가 많아 사제(沙堤) 마을, 사재라 불렸으나, 훗날 그의 호를 따서 도촌리로 불리게 되었다.
공북헌 근처에는 이수형이 지은 정자 송고정(松皐亭)이 있었다. 송고정의 편액은 금파 박우현(錦坡 朴遇賢)이 썼고, 조선 말기의 한학자 수산 김휘철(睡山 金輝轍)은 소나무의 속성과 의미를 설명한 송고정기(松皐亭記)를 남겼다.[14] 이 정자는 김휘철이 살던 1900년대 초까지는 존재했으나, 언제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수형은 공북헌에 거주할 때 손수 괴화나무를 심어 시름을 달래고 시문을 읊는 낙으로 삼았다. 전설에 따르면, 이수형이 사망하자 그가 심었던 괴화나무도 함께 고사했는데, 1715년 단종이 복위되자 괴화나무도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고 한다. 이 괴화나무는 1950년 한국전쟁 때 고사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해진다.
이수형과 관련된 다른 유적들은 다음과 같다.
7. 평가
세조는 이후에도 어모장군 충좌위 부사직, 상장(상호군), 호군 등 여러 번 벼슬을 내리며 불렀지만, 이수형은 모두 거절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는 장인인 문절공 김담 외에도 원호(元昊)‚ 조려(趙旅)‚ 송석충(宋碩忠) 등과 교류하며 시름과 회한을 달랬다. 자신이 은거한 공북헌 옆에는 괴화나무를 직접 심고, 그 주변을 산책하며 시문을 읊기도 했다.
성종 대인 1476년(성종 7년) 11월 29일 다시 직위와 작첩이 내려졌으나[15], 이 역시 받지 않고 거절했다. 그는 70년 동안 단종을 추모하며 한성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학자 성재 권상익(省齋權相翊)은 "보통 사람은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이곳에서 선생은 70년을 보냈다. 그러나 선생은 이곳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고 이름을 짓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16] 그의 저서로는 《도촌선생실기》(桃村先生實紀)와 《괴단감광록》(槐壇曠感錄)이 있다.
후대의 인물인 고심당 조정융(古心堂 趙廷瀜)은 이수형에 대해 '고요한 심지는 자취가 없으나 완고한 이를 절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공이 있으니, 동강의 높은 자취와 율리의 맑은 풍모와 같다(靖志無跡廉頑有功 桐江高躅栗里淸風)'고 평하며, 그의 고결한 절조를 도연명에 비유했다.
사후 사림들에 의해 충청도 공주 동학사 숙모전(肅慕殿)에 배향되었다. 1608년(광해군 2년)에는 경상도 순흥 지역 사림들의 공론에 따라 순흥 도계서원에 금성대군 이유,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 등과 함께 제향되었다. 그러나 도계서원은 대원군 집권기의 서원 철폐정책으로 인해 철폐되어 현재는 건물만 남아 있다.[9] 1731년(영조 7)에는 영월의 사림들이 창절사(彰節祠)에 추가로 배향할 것을 논의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사되지 못했다.
1799년(정조 23) 영남의 선비들이 간행한 《영남인물고》의 순흥편에 그의 이름이 수록되었으며, 연경재 성해응(成海應)의 《장릉병의제신전(莊陵秉義諸臣傳)》에도 그의 행적이 간략하게 기록되었다.
1858년(철종 9년) 경상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학사 임응준(任應準)의 상소로 증 통정대부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에 추증되었다.[9] 이후 노원 김철수(魯園金喆銖)는 '도촌이공청가증장(桃村李公請加贈狀)'이라는 상소 초안에서 이수형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상소문 초안은 그의 문집 《노원만록(魯園謾錄)》 2권에 실려 있다.
고종 때인 1870년(고종 7년) 12월 24일, 충절이 뛰어나다는 고종의 특명으로 다시 증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摠府 副摠官)에 추증되었다.[17][9]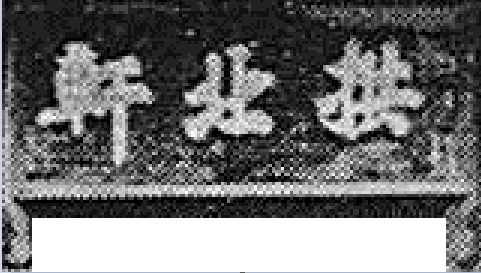
8. 기타
단종이 사사되자 그는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삼면이 벽이고 북쪽으로만 문이 난 집을 짓고 은거했다. 이는 단종의 능침인 장릉이 있는 영월이 당시 거처하던 영천의 북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 집이 공북헌이다.
이후 70년간 공북헌 앞 괴화나무를 벗 삼아 시를 읊고 몇몇 선비들과 교류하며 단종을 추모하는 삶을 살았다. 9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한성에 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공북헌 근처에는 지역 유림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견일사(見一祠)가 있다. 후에 견일사에는 금성대군, 순흥부사 이보흠이 함께 배향되었고, 도계서원으로 사액되었다. 그의 4대손인 취사 이여빈 등도 추가로 배향되었다.
그의 이름 '수형(秀亨)'이 '수정(秀亭)'으로 잘못 기록되어 전해지기도 한다.
참조
[1]
뉴스
'[이정웅의 노거수와 사람들] 단종 향한 일편단심…세인 관심 끌어'
http://www.imaeil.co[...]
매일신문
[2]
웹사이트
宣城 金氏 撫松軒 金淡 (선성 김씨 무송헌 김담)
http://weekly.hankoo[...]
[3]
뉴스
⑩ 도촌 이수형과 공북헌
http://www.kbmaeil.c[...]
경북매일
2011-03-31
[4]
뉴스
22편 봉화 도계서원
http://andongmbc.co.[...]
안동MBC
[5]
문서
넷째 아들 참봉 이준근의 장인
[6]
서적
눌옹유사 권지일(訥翁遺事卷之一), 사우록
[7]
역사기록
세종실록 61권, 1433년(세종 15년, 명 선덕 8년) 9월 3일 임오 3번째기사, "이인숙·노종덕·안계인이 하직하다"
[8]
역사기록
1476년 발간한 안동권씨 성화보에는 이경창의 직책이 별좌로 나타난다.
[9]
웹인용
¿ì°èÀ̾¾Áß¾Óȼöȸ(http://www.WooGaeLee.Org
https://web.archive.[...]
2008-07-05
[10]
웹사이트
'[영월문화원홈페이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http://yeongwol.kccf[...]
[11]
웹사이트
유교넷 유교역사관 - 인물정보
http://www.ugyo.net/[...]
[12]
서적
이인행, 新野集 권6, 記 "拱北軒重修記"
[13]
서적
권성오(權省吾), 동암집 곤(東巖集 坤)권 "桃村李先生遺事"
[14]
서적
김휘철, 睡山文集 卷5/記, "松皐亭記"
[15]
역사기록
성종실록 73권, 1476년(성종 7년, 명 성화 12년) 11월 29일 기사 5번째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정혼 등의 직첩을 되돌려주게 하다"
[16]
서적
권상익(權相翊), 성재집 오(省齋集 五) / 千仭室記 18(千仭室記 18)
[17]
역사기록
승정원일기 고종 7년 경오(1870) 12월 24일(을유) 맑음 36번째 기사, "남계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18]
문서
문과급제 후 직제학, 사후 증 좌참찬
[19]
문서
음보로 선교랑 관상감주부를 역임하고 [[생원]]시 급제후 사헌부감찰, 홍천현감에 이르렀다. 선영을 오가는 길에 말이 피하는 곳이 있으므로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꿈에 [[금성대군]]을 본 후 그곳에 [[금성대군]]을 추모하는 [[금성단]]을 축성했다.
[20]
웹사이트
종가기행 46: 宣城 金氏 撫松軒 金淡 (선성 김씨 무송헌 김담)
http://weekly.hankoo[...]
주간한국
2016-03-0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