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윤보선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1897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경성부 교동보통학교와 일본 게이오 의숙 등에서 수학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하야했다. 이후 야당 지도자로 활동하며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고, 1990년 사망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제6대 대통령 후보 - 박정희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군인, 정치인으로서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거쳐 제5~9대 대통령을 역임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으나, 유신 체제를 통해 장기 집권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후보 - 김창숙
김창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 교육자, 언론인, 정치인으로서, 의병운동 참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성균관 재건 및 성균관대학교 설립,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 - 충청남도 출신 정치인 - 김종필
5·16 군사정변 주역이자 초대 중앙정보부장,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낸 김종필은 한일 국교 정상화 기여와 '김-오히라 메모' 논란, 9선 국회의원, DJP 연합을 통한 총리 재임 등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면과 지역주의 정치의 상징으로도 평가받는 정치인이다. - 충청남도 출신 정치인 - 안희정
안희정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충청남도지사를 두 차례 역임했으나, 성폭력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윤보선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윤보선 |
| 한자 | 尹潽善 |
| 로마자 표기 | Yun Boseon |
| 호 | 해위(海葦) |
| 자 | 경천(敬天) |
| 출생일 | 1897년 8월 26일 |
| 출생지 | 조선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현재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 |
| 사망일 | 1990년 7월 18일 |
| 사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
| 묘지 | 아산 윤씨 가족 묘지 |
| 국적 | 대한민국 |
| 본관 | 해평 윤씨 |
| 종교 | 개신교(예장통합) |
| 학력 | |
| 모교 | 에든버러 대학교 (문학 석사) |
| 대학원 | 에든버러 대학교 고고학 석사,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석사 수료 |
| 가족 관계 | |
| 배우자 | 민경숙 (1915년 결혼 ~ 1937년 사별) 공덕귀 (1948년 재혼) |
| 자녀 | 4명 |
| 부 | 윤치소 |
| 모 | 이범숙 |
| 조부 | 윤영렬 |
| 친척 | 윤치성(삼촌) |
| 대통령 재임 정보 | |
| 대통령 직책 | 대한민국 대통령 |
| 재임 시작 | 1960년 8월 13일 |
| 재임 종료 | 1962년 3월 24일 |
| 국무총리 | 허정 장면 장도영 송요찬 |
| 이전 대통령 | 이승만 |
| 다음 대통령 | 박정희 |
| 기타 공직 및 정치 경력 | |
| 서울특별시장 | 직책: 서울특별시장 임기 시작: 1948년 12월 15일 임기 종료: 1949년 6월 5일 이전 시장: 김형민 다음 시장: 이기붕 |
| 상공부 장관 | 직책: 상공부 장관 임기 시작: 1949년 6월 6일 임기 종료: 1950년 5월 9일 |
| 정당 | 민주당 (1955년) 신민당 (1967년) |
| 국회의원 | 4선 |
| 당 고문 | 민주당 고문 |
| 서명 | |
 | |
| 헌정회 | |
| 헌정회원 | 891 |
2. 생애
윤보선은 1897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나 1930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32년 귀국 후, 1945년 광복과 함께 정계에 입문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관, 서울 시장, 상공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며 대한적십자사 총재, 국회의원을 거쳐 1955년 야당인 민주당 창당에 참여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새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직에 잠시 남았다가, 1962년 군정이 제정한 정치활동정화법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이후 야당 정치인으로 박정희 정권에 맞서 1963년과 196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70년대에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10·26 사태 이후 최규하 정부에서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맡았고, 서울의 봄 당시 김영삼, 김대중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으나 실패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국정자문회의에 참여하며 정부에 협력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를 지지했다.
1990년 7월 18일,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자택에서 92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유해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의 가족묘에 안장되었다.
2. 1. 생애 초기

윤보선(尹潽善)은 1897년 조선 광무 원년 8월 26일 충청도 아산군(현재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에서 아버지 윤치소(尹致昭, 1871–1944)와 어머니 이범숙(李範淑, 1876–1969) 사이에서 태어났다. 윤치소는 윤영렬(尹英烈)의 차남으로, 윤영렬은 조선의 저명한 학자이자 관리였던 윤두수(尹斗壽)의 8대손이다.
1903년(광무 7년) 한성부(현재 서울특별시)의 교동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광무 11년/융희 원년)에 졸업하였다. 1910년(융희 4년) 4월 경성부(경성)의 경성일출소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다. YMCA에 드나들면서 YMCA 간사였던 이승만과 이상재와 교류하였다. 1913년 경응의숙 의학부에 입학하였으나 2학기 만에 그만두었고, 정칙영어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퇴하였다.[5]
1917년 상하이로 건너가 신규식(申圭植)의 집에 머물렀으며, 1919년 3·1 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21년 6월 상하이를 떠나 영국으로 유학, 스칼리시 학교, 우드브룩 칼리지, 옥스퍼드 대학교를 거쳐 1930년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32년 조선으로 귀국하였다.[5]
2. 1. 1. 출생과 가계 배경
해위 윤보선은 1897년 8월 26일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신항리(현 아산시 둔포면 신항1리 143-1)에서 아버지 윤치소(尹致昭)와 어머니 이범숙(李範淑)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유아기에는 잠시 한성부에서 지냈다. 아버지 윤치소는 중추원의관을 지냈고, 어머니 이범숙은 중추원의관을 지낸 이재룡(李載龍, 다른 이름은 이봉하(이재룡)(李鳳夏))의 장녀였다. 윤보선의 선조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음 윤두수였고, 할아버지 윤영렬과 종조부 윤웅렬은 당시 높은 관직에 있었다. 대한제국 말기 개혁가 윤치호는 윤웅렬의 아들로 윤보선의 당숙이었다.윤보선의 10대조 윤두수와 윤근수는 조선 선조 때 형제 재상이었다. 9대조 윤흔은 선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삼사를 거쳐 자헌대부 중추부지사에 이르렀고, 호종공로로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8대조 윤취지는 광해군 때 생원시에 합격하고 가선대부 중추부동지사를 지냈다. 7대조 윤채(尹埰, 1603~1671)는 인조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세자익위사 사어를 지냈다. 6대조 윤세겸(尹世謙, 1668~1748)은 윤채의 아들이며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를 지냈다.
그러나 5대조 윤발(尹潑, 1728~1798) 대에 가계가 몰락하여 관직을 지내지 못했고, 사후에 증 호조참의와 통정대부 비서원승에 추증되었다. 고조부 윤득실(尹得實, 1768~1823)은 통덕랑이 최종 관직이었고, 사후에 증 이조참의와 의정부공찬에 추증되었다. 윤득실이 일찍 사망하여 형제들은 고아가 되었지만, 윤득실의 셋째 아들이자 윤보선의 증조부였던 윤취동 대에 농토를 마련하여 부농이 되었고, 윤취동은 한직인 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종조부 윤웅렬이 무과에 급제하고 조부 윤영렬이 중앙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당숙 윤치호가 대한제국에서 외무부, 학부 협판과 한성부판윤을 지내며 가세를 일으켰다. 조부 대에 100칸의 집을 마련했다. 윤보선이 태어난 이듬해 윤치영이 태어났는데, 윤치영은 그의 숙부였다. 아버지 윤치소와 어머니 이범숙은 모두 아산군의 만석꾼 집안 출신이었다.[22]
2. 1. 2. 유년기와 학창 시절
해위 윤보선은 하인들을 많이 거느린 귀족 양반가 출신이다. 해위의 회고록에 의하면 '집안은 부유하였고 선대(先代)는 대대로 벼슬을 해온 집안이었기에 부러운 것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스스로 회고하였다.[23] 그가 어려서 자란 안동장은 99칸의 대저택이었다.

윤보선은 3백 석 이상을 걷는 대농 집안에서 태어났다.[24] 증조할아버지 윤취동 이후 아버지 윤치소가 이재와 수완에 밝아 대농토를 꾸렸다. 큰아버지 윤치오가 친구들의 빚보증을 섰다가 막대한 빚을 졌지만, 아버지 윤치소의 재력으로 그의 집안은 여전히 부유했다.
그의 조부 윤영렬은 삼도 토포사를 지낸 고관으로, 윤영렬이 삼남 토포사로 부임했을 때 그의 일가는 충남 아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비상하였던 그는 유아기 때 '조부가 토포사로 직인을 찍거나 먹찰 하는 것, 집안에서 사무를 보며 죄수들과 병사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기억하였다.[23] 그 뒤 집안에서 선생을 두고 한문을 익혔다.[25] 할아버지 윤영렬은 틈틈이 그들 형제를 불러 충과 효를 강조하고 삼국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때 그는 유비의 의로움과 관운장의 전공치적과 그의 충의에 감동받았다 한다.[25] 할아버지 윤영렬은 그의 고조부 대에 약주가 과하여 가세를 기울게 하였다 하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훈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이 때문에 윤보선은 여행지에서나 정계에 입문한 뒤에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25] 총명하고 명석했던 그는 한편으로 아쉬울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 성격적으로 다소 고집이 센 측면도 갖게 되었다.
윤보선(尹潽善)은 1897년(광무 원년) 8월 26일 충청도 아산군(현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서 아버지 윤치소와 어머니 이범숙의 아들로 태어났다. 1903년(광무 7년) 한성부(현재 서울)의 한성부 교동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광무 11년/융희 원년)에 졸업하였다. 그 후, 1910년(융희 4년) 4월 경성의 경성일출소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다. YMCA에 드나들면서 YMCA 간사로 활동하던 이승만과 YMCA를 주도하던 이상재와 친분을 쌓았다. 소학교를 졸업한 후, 1913년에 경응의숙 의학부에 입학하였으나 2학기 만에 그만두고 다시 정칙영어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퇴하였다.[5]
2. 2. 청년기
윤보선은 충청남도 아산 향리에서 지내다 을사늑약 체결 직후 한성부로 이사하여, 10세 때 집 근처 교동보통학교에 입학해 신학문을 접했다.[25] 1907년 국채보상운동 당시에는 용돈을 모아 헌금하기도 했다.[26]1910년 교동보통소학교를 졸업하고 충무로의 일본인 거류민들이 설립한 일출소학교 5학년으로 편입했다.[26] 이 무렵 이승만을 만나 그를 존경하게 되었으나,[27] 1950년 이후 정치적 노선 차이로 갈라서게 되었다.
서인과 노론 계열 선조들의 영향을 받아 양반 가문 후예라는 의식을 가졌으며,[28] 1912년 일출소학교를 졸업한 후 평범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
2. 2. 1. 중국 망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1917년, 윤보선은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신규식의 집에 머물렀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5]2. 2. 2. 영국 유학 생활
그는 유학 생활이 어렵지 않았다. 집에서 월 25KRW의 학비를 부쳐와 학업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당시 그의 관심사는 중국의 신해혁명에 쏠려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귀국하게 되었다.[22] 1911년 중국에서 일어난 신해혁명에 자극을 받아 학업을 마칠 수 없었다고 한다.[22] 귀국 이후 한동안 집에 머물렀다. 이후 그는 신문에서 신해혁명 관련 기사를 찾아 읽곤 했다.[31]그는 여운형을 만났는데, 당시 여운형은 독립운동에 가담하려는 청년들을 중국으로 비밀리에 망명시키는 것을 돕고 있었다.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것을 집안에서 알면 반대할 것이었으므로, 그는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며 자금을 모았다.
상하이로 바로 가서 독립 운동에 투신한다면 집안에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었으므로, 그는 아버지 윤치소에게 미국으로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근처 양반가의 자제도 기독교 집안이 된 뒤, 목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목사가 된 것을 그의 부친도 알고 있었다. 그는 상하이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간다고 하였고, 아버지 윤치소는 그에게 상하이로 갈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2. 2. 3. 귀국과 국내 활동
1932년 조선으로 귀국한 후에는 은거 생활을 이어갔다.[5]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인 1945년 9월 1일, 허정, 김도연 등 보수 인사들을 모아 한국민족당을 결성했다. 10월 4일에는 미군정청으로부터 농상국 상급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1947년 4월에는 경영난에 빠진 민중일보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어 이승만의 선전을 펼쳤다.[5]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총선거에 한국민주당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같은 해 8월 이승만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고, 12월 제2대 서울시장에 임명되었다. 1949년 6월 6일에는 상공부 장관이 되었으나, 1950년 5월 9일 이승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상공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 또한, 1949년~1950년에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6]
1950년 11월 대한적십자사 초대 총재에 취임했으나, 2년 후인 1952년 9월 2일에 사임했다.
2. 3. 광복 직후
1945년 광복 직후, 윤보선은 일본에서 귀국한 여운형을 만나 그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다. 중화민국 상하이에 도착한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여운형은 윤보선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32] 윤보선은 신학을 공부한다는 핑계로 아버지 윤치소를 설득하여 출국 허가를 받았다. 그는 여운형의 주선으로 배편을 타고 인천항을 떠나 상하이에 도착했다.[33] 뒤늦게 윤보선의 독립운동 투신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이승만을 원망했지만, 실제로 윤보선의 망명을 주선한 것은 여운형이었다.2. 3. 1. 한국민주당 창당과 정치 활동
1945년 9월 1일, 허정, 김도연 등 보수 인사들을 모아 한국민족당을 결성했다.[5] 1947년 4월에는 경영난에 빠진 민중일보를 인수하여 사장이 되어 이승만을 선전했다.[5]2. 4. 정치 활동
윤치영은 광복절 이후 정계에 입문했으며, 이승만 박사의 스승이었다. 1947년까지 윤치영은 한국 참모총장의 비서관으로 일했다. 1948년 이승만은 윤치영을 서울 시장으로 임명했으나, 곧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정책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그는 1954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55년 야당인 한국민주당을 공동 창당했고, 1959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원이 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자, 윤보선은 8월 13일 새롭게 선출된 국회에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기에, 윤보선은 의례적인 대통령 역할만 수행했다.
박정희의 1961년 쿠데타 이후, 윤보선은 새 정권에 어느 정도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리에 남았으나, 1962년 3월 22일에 사임했다. 이후 몇 차례 반정부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 그는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했으며, 1963년과 1967년 대통령 선거에 두 차례 출마했으나 모두 패배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갑 지역구에 민주국민당(민국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5] 1955년 9월 민국당 등 보수 야당 세력이 연합하여 민주당을 결성하자 초대 의원 부장에 취임했다.
1958년 5월 2일 제4대 대한민국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갑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1959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었다. 이 시기에 신익희, 조병옥 등 민주당 구파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윤보선은 김도연과 함께 구파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196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3·15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장을 역임하며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다.[5]
2. 4. 1. 서울특별시장과 상공부 장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2월 제2대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었다.[6] 1949년 6월 6일에는 상공부 장관이 되었으나, 1950년 5월 9일 이승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상공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6] 1949년부터 1950년까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6]2. 4. 2. 한국 전쟁과 이승만과의 결별
1948년 8월 이승만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고, 그해 12월 제2대 서울시장에 임명되었다. 1949년 6월 6일에는 상공부 장관이 되었으나, 1950년 5월 9일 이승만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상공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6] 1949년~1950년에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6]1950년 11월 대한적십자사 초대 총재에 취임했으나, 1952년 9월 2일에 사임했다.
2. 4. 3. 민주당 활동과 제4대 대통령 당선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갑 지역구에 민주국민당(민국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5] 1955년 9월 민국당 등 보수 야당 세력이 연합하여 민주당을 결성하자 초대 의원 부장에 취임했다.1958년 5월 2일 제4대 대한민국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갑 지역구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했다. 1959년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었다. 이 시기에 신익희, 조병옥 등 민주당 구파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윤보선은 김도연과 함께 구파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196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3·15 부정선거 진상조사단장을 역임하며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다.[5]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자, 여당이 된 민주당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신파와 구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을 보였다. 이후 치러진 제5대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하고, 8월 12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4] 민주당 구파의 지도자인 윤보선은 신파의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 내각 구성과 국정 운영에서 여전히 구파와 신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5] 이듬해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쿠데타 군의 요청으로 대통령직에 남았으나, 이듬해 3월 군정이 제정한 정치활동정화법에 항의하여 하야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였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했다.[5]
2. 5. 대통령 재직 시절 (1960~1962)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윤보선은 1960년 8월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윤보선은 의례적인 대통령 역할만 수행했다.[4]1961년 쿠데타 이후에도, 윤보선은 새 정권에 어느 정도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대통령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러나 1962년 3월 22일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정한 정치 활동 정화법에 항의하여 사임했다.[1]
2. 5. 1. 윤보선 정부와 장면 내각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자, 새롭게 여당 세력이 된 민주당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소위 신파와 구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했다. 이후 치러진 1960년 7월 29일의 제5대 총선에서 3선을 하고, 같은 해 8월 12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4] 민주당 구파의 지도자인 그는 신파의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 내각 구성과 국정 운영에서 여전히 구파와 신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5]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쿠데타 군의 요청으로 대통령직에 남았으나, 이듬해 3월 군정이 제정한 정치 활동 정화법에 항의하여 하야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였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했다.[5]
2. 5. 2. 5.16 군사정변과 대통령직 사퇴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의원내각제로 전환된 후, 1960년 8월 12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4] 민주당 구파의 지도자인 그는 신파의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했지만, 내각 구성과 국정 운영에서 여전히 구파와 신파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어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5]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하자 처음에는 정변을 반대하였으나, 곧 쿠데타 군의 요청으로 대통령직에 남았다. 그러나 군정이 제정한 정치 활동 정화법에 항의하여 1962년 3월 22일에 하야했다.[29] 이후 몇 차례 반정부 활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 하야의 배경에는 박정희의 구정치인 활동금지법에 반발했다는 주장이 있다. 퇴임 후에는 안국동 사저인 안동장에 칩거하였다. 4·19 혁명으로 청와대의 주인이 되었던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이 마땅치 않다면서 박정희가 나오게 해서 나왔어도 감시와 연금이 되풀이 되는 불행한 나날을 살다가 여생을 마쳤다.[106]
대통령직을 사퇴한 후 윤보선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107]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야당 공격의 선봉에 선 윤보선은 대통령(권한대행)과 공화당 의장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107] 또한 군정 세력의 민정이양은 허구이며 군정 세력의 정권 연장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1963년 3월 박정희가 군정연장안을 발표하자, 윤보선과 허정은 각각 측근들을 데리고 서울시내에서 산책데모를 하였다. 1963년 3월 16일 낮 2시 55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초대로 전 국무총리 장택상, 신민당 위원장 김도연, 초대 국무총리 이범석 등과 함께 박정희와 면담하였다.[108][109]
윤보선은 '3.16 성명이 박의장의 깊은 사려에서 나온 줄은 모르는 바가 아니나... 세상 만사가 그렇게 박의장이 제안한 것처럼 척척 될는지도 의문이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은 바로 이승만 박사의 사고방식과 같다. 인간 개조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점진적으로 이룩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110]'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군인의 사명은 국방에 있으니 만큼 군인들은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였다.[110] 윤보선의 말을 듣던 박정희는 노하며 오죽 당신네들의 과오를 못 참았으면 군인들이 일선에서 돌아 왔겠느냐 며 응수했다.[111] 논쟁이 격화되자 장택상이 화제를 돌려 논쟁을 막았다.
2. 6. 야당 활동과 민주화 투쟁 (1962~1979)
1963년 9월 12일, 윤보선은 민정당을 결성하고 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같은 해 10월 15일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정희 후보(민주공화당)에게 15만 7천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5] 이어진 11월 25일에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 소속으로 전국구 의원에 당선되었다.1965년 5월 3일, 야당 제2당이었던 민주당과 합당하여 결성된 민중당의 당수(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박순천에게 패배했다. 같은 해 7월 28일, 한일기본조약의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7] 의원직 사퇴로 항의하고 민중당을 탈당했다.[8] 이듬해 3월, 그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한 의원들과 함께 신한당을 결성하고 당 총재에 취임했다.
1967년 2월 7일, 민중당과 신한당이 합당하여 신민당이 결성되었고, 윤보선은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5월 3일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게 패배했다.
1971년 1월 6일, 국민당을 결성하고 당 총재에 취임했다.
1970년대 윤보선은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76년 3월 1일, 김대중 등과 함께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9] 1978년 2월 24일, 함석헌과 함께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10] 이는 정부로부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불법 활동"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 판결을 받았다. 1979년 YMCA 위장 결혼식 사건에도 참여했다.
2. 6. 1. 하야 직후와 1960년대 야당 활동
1963년 3월 박정희가 구 정치인 정치활동법 제한(정치정화법)을 강행하고 군정을 연장시키자 윤보선은 이윤영, 장택상 등과 군정연장 반대투쟁을 진행했다.[112] 장면이 병으로 정당활동을 순조롭게 하지 못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야당의 지도급 인사로 부상했다. 그러나 허정 등 일부는 그의 지도력에 반발하며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3월 16일 박정희가 군정연장을 선언하는 3·16 선언을 발표하자, 3월 19일 윤보선·김도연·장택상·김준연·이범석 등은 박정희에게 3·16 성명의 저의를 추궁하였다.[112] 한편 야당 인사들 중에는 그가 5·16 군사 정변 당시 장면, 정일형 등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군사쿠테타를 방조하였다며 그의 리더십을 거절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군정 반대와 박정희 퇴진 운동에 적극 앞장섰으므로 반대파들의 음해와 공격은 일시적으로 누그러졌다.3월 20일 허정 등과 함께 서울시청과 을지로 주변, 주한미국 대사관 주변 등을 활보하며, 박정희의 군정연장에 반대하는 '산책시위'를 했다. 3월 30일부터 윤보선과 함께 3차례 박정희와 조야영수회담을 개최하여 박정희의 군정연장을 철회시켰다.[112] 이후 그는 박정희를 군정의 실질적인 지도자라며 박정희의 퇴진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야당이 난립하게 되니까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113] 그러나 통합야당으로 국민의당을 만들었지만 바로 깨져버렸고[113],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113] 통합야당 국민의당 붕괴에는 민주당 구파의 실력자 유진산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113] 이 당시 유진산은 윤보선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었다.[113]
3월 22일 윤보선·변영태·박순천 등의 재야지도자들은 '민주구국선언대회'[114]를 열어 군정연장봉쇄를 결의하고 가두데모에 나섰다. 1963년 초 윤보선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선언하였다. 1963년 5·16 군사 정변 이후 해체되었던 신민당 및 민주당 구파 세력을 규합하여 5·16군사정변 세력이 참여한 민주공화당에 맞서기 위해 민정당(民政黨) 창당에 참여하였다.

(1960년대 초반 야당의 주도권을 놓고 그와 경합하였다.)
1963년 7월 그는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그러나 허정은 본래 야당 단일후보로 김병로가 지목되면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해위(윤보선)라면 양보할 용의가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였고, 윤보선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대통령 후보 윤보선의 사퇴로 대통령 후보는 허정과 김도연의 2파전으로 압축되었지만 사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김도연이 포기를 선언해 후보경쟁은 다시 윤보선과 허정의 대결로 전환되었다.[115]
허정은 5·16 군사 정변 당시의 그의 묵인을 지적하며 처신문제를 질타했다. 매그루더 사령관과 마셜 그린 주한미국 대사 및 미국무성 관리들로부터 '군사혁명의 저지를 위해 UN군 병력을 동원할 허가를 받으려고 혁명이 일어난 직후 대통령 윤보선을 찾아갔다고 한다. 그때 장면 총리는 은신 중이어서 윤 대통령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3시간 여에 걸쳐 병력 동원을 허가해주기를 간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허락해주지 않았다고 한다.[96] 그린 주한미국 대리대사는 '국헌 준수를 서약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만큼, 지금 병력 동원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의무의 포기가 아닌가'하고 힐난까지 했다는 것이다.[96] 허정은 그가 장면에 대한 적대심 때문에 정변을 묵인했다며 그의 자질을 의심했고, 윤보선은 자신이 군사 정변을 추인하지 않은 점과, 장면 내각 당시 데모와 부정 부패가 심했음을 들어 반박, 심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허정은 1963년 9월 24일 "혁명을 합법화시키고 정치정화법에 도장을 찍어놓고 대통령 후보를 사퇴한다, 출마한다고 하는 윤보선씨야말로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116]
허정은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상 자신이라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그 뒤 허정은 그가 5.16 군사 정변에 호응한 점과 혁신 세력의 반발을 들어 김병로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하라고 종용하였으나 윤보선은 양보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고, 허정은 그가 독단적이고 고집에 세다며 질타했다. 윤보선이 대통령 후보로 지목되자 허정은 양보할 수 없음을 들어 끝까지 경선에 나서 경합하였으나, 결국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 허정이 자진 용퇴하면서 윤보선은 야당의 범야권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었다.
그 뒤 최종 지명되어 출마, 유세 도중 박정희의 공산주의 활동을 지적, 비판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63년 9월 2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지방 유세에서 그는 '여순 반란 사건의 관련자가 정부안에 있으며 박 의장의 민족주의 사상을 의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상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되었다.[107][117] 윤보선의 유세는 언론에 의해 사상 논쟁으로 묘사되었다. 공화당은 윤보선을 미국 상원의원을 역임한 존 매카시 의원의 사상에 사로잡힌 과격분자로 규정하고, 그의 주장은 얄팍한 술책이며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하였다.[107][117] 박정희는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이라며 맞받아쳤고, 윤보선은 그가 친일파, 공산주의자라며 조국을 두 번이나 배신했으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5대 대선 유세에서 그는 빈익빈이 민주화냐, 썩은 정치 뿌리뽑자고 호소하였다. 한편 유세중 기자들이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을 집요하게 물어오자,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그는 당선된 뒤에 밝히겠다고 하고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였다.
선거 운동이 한고비에 이르렀을 무렵, 9월 28일 윤보선 후보는 다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여순 사건의 관련자가 정부 안에 있다.[118]"는 연설을 통해 박정희 후보가 여순 사건에 관련됐다는 시사를 했다.[119] 이로써 전국은 발칵 뒤집혔다. '여순반란 사건의 관련자라면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였단 말인가, 박정희가 말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는 그럼 공산주의를 가리킨 것이냐[119]'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박정희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의로 공산주의 의혹을 부풀려 올렸다.
1963년 여름 김준연은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는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여 파문을 던졌다. 윤치영 등이 박정희의 전향은 확실하며 자신이 내무장관 때 사상을 보증했다고 했지만, 김준연이 다시 박정희의 사상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확산되었다. 김준연은 박정희에게 사상 검증을 하자고 하였다. 공화당 측에서는 윤보선이 김준연을 사주하여 흑색선전을 한다고 맞받아쳤다.
9월 28일 윤보선의 지지 유세를 하던 김사만(金思萬)은 '박정희는 여순반란 사건에 관련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공산주의자였다[120]'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몰라도, 우리의 주적인 공산당 혐의를 받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믿고 투표할 것이냐"라며 박정희를 공격했다.[120]
김사만은 "여순반란 사건의 관련자가 정부 안에 있는 듯하다"라고 한 윤보선의 전주 발언이 "(김준연의 폭로에 비교하면) 그 얼마나 점잖은 표현이냐"며 윤보선을 옹호하고 "박정희씨는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이 되겠다고 만주군관학교를 거쳐 더 출세하겠다고 일본에 가지 않았느냐"며 맹비난을 가했다.[120] 바로 공화당에서 김준연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하고 윤보선과 신민당을 매카시즘에 사로잡힌 무리들이라며 공격하고 나섰다.
1963년 9월 23일 윤보선은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돌며 선거 유세를 하였다. 그런데 9월 23일 박정희는 KBS 방송을 통해 윤보선을 공격, "이번 선거는 개인과 개인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적 이념을 망각한 가식의 민주주의 사상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대결"이라고 하였다.[121] 1963년 9월 24일 그는 전라북도 전주에 도착하였다.
"기아·부패·실업·분열 등 군정의 5악을 몰아내고 민정으로 새 질서를 수립하자[121] "고 외치던 윤보선은 9월 24일 전주 유세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121]
윤보선은 "내가 할 말 그사람이 했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지금은 민주주의와 가장된 민주주의, 즉 이질적 민주주의와 대결하고 있는 것[122]"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이질적 민주주의'가 무엇을 가리키느냐인데, 윤보선은 이어서 "9월 23일의 여수 강연에서 특별히 느낀 것은 여순 반란 사건의 관계자가 지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상기했다."라고 말했다.[122] 박정희가 여순 사건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의 민족 사상이나 민주주의 사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122]
1963년 9월 윤보선은 공화당과 박정희 후보 측으로부터 피소당하였다. 공화당 측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윤보선 후보는 "그렇다고 해서 박 의장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하곤 "하지만 그의 민주주의 신봉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119]
박정희는 9월 28일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용공주의 세력을 혁명으로 일소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123]를 막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119] 한편 윤보선의 삼촌인 윤치영은 윤보선의 경쟁자인 박정희의 선거사무장이기도 했다. 9월 30일 윤치영은 "썩은 구정치인이 집권하면 또다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124] 일각에서는 윤보선의 의혹을 사상공세라고 비난하였고, 숙질간의 싸움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9월 28일 윤보선의 지지 유세를 하던 김사만은 '박정희는 여순반란사건에 관련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공산주의자였다[120]'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몰라도, 우리의 주적인 공산당 혐의를 받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믿고 투표할 것이냐"라며 박정희를 공격했다.[120] 김사만은 "여순반란 사건의 관련자가 정부 안에 있는 듯하다"라고 한 윤보선의 전주 발언이 "(김준연의 폭로에 비교하면) 그 얼마나 점잖은 표현이냐"며 윤보선을 옹호하고 "박정희씨는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이 되겠다고 만주군관학교를 거쳐 더 출세하겠다고 일본에 가지 않았느냐"며 맹비난을 가했다.[120] 공화당에서 김준연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자 김준연은 차라리 고소를 할테면 해보라며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응수한다. 윤보선은 김준연과 함께 박정희에게 과거 전력에 대해 속시원히 털어놓으라고 공세를 펼쳤다.
윤치영이 박정희의 선거사무장으로 선거관리를 총괄하면서 야당인사인 허정, 김준연과 야당의 대선 주자인 윤보선과도 갈등하였다. 윤보선의 어머니이자 윤치영의 형수인 이범숙이 윤치영의 안국동 집에 찾아와 통곡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윤치영과 윤보선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화가 난 윤보선은 윤치영을 만났을 때 악수를 거절한다.
윤보선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의로운 학생들이라며 손수 부인 공덕귀, 비서관, 함석헌 등을 대동하고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1965년 4월 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셜 그린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는 서울 중구 정동의 미 대사관저에 윤보선 민정당 총재를 초대하여 한일회담과 관련한 요담을 했다. 그린 副차관보는 5·16 군사 혁명 때는 대리대사로서 당시 윤 대통령을 찾아가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쿠데타軍(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동원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한 인연이 있었다.[141] 윤보선은 김준연 등을 대동하고 마셜 그린 부차관보를 면담했다. 이날 민정당의 김준연 의원은 그린 副차관보를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그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박정희의 방미(訪美) 정상회담 계획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었다.[141]
그린 부차관보는 '한일 국교회담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윤보선과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보선은 한일회담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셜 그린은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의 이익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142] 윤보선과 마셜 그린의 회담을 불쾌하게 여긴 박정희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박정희는 이 사실을 보고한 박상길 청와대 대변인에게 "그 X버선인지 헌 버선(편집자 註-윤보선을 지칭)인지 하는 자가 하는 말을 나는 다 알고 있지. 새카만 일본 헤이타이(兵隊) 출신인 째그마한 내가 … 제까짓 게 뭘 알겠느냐, 이런 말 아니오?[141]"라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보선은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며 그것이 박정희 씨의 인격이고 수준이라고 응수하였다.
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박정희가 나왔고 야당은 윤보선이 대표주자를 하게 되었다.[150] 윤보선이 출마하자 그의 주변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그의 선거를 도왔다. 강원용은 5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 후보가 당선되어 박정희의 재집권을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그를 돕는 일에 간접적으로 나마 나섰다.[151] 강원룡은 윤보선 후보에게 직접 자금을 전해 주지 못하는 기업인들을 대신해서 자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몇 차례 맡았다.[151] 국민들에게는 '겉으로는 강원룡이 윤보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151]'처럼 인식되었다.
1967년 5·3 대통령 선거의 유세에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는 경제개발의 성과와[145] 비전을 내세우면서, 이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에 신민당의 윤보선은 쿠테타 이후에 추진된 경제개발의 폭력성과 독재성을 규탄했다.[152] 신민당 진영에서는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과 사회주의 사상 경력을 집중 부각, 지적하였다. 윤보선은 이때는 사상논쟁을 할 생각은 없었고, 박 정권의 부정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부정부패 바로잡겠다", "썩은 정치 바로잡겠다.[150]"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다시 박정희의 남로당 관련 전력이 다시 불거졌고, 박정희가 배신자임을 들어 신의없음을 지적하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를 서중석은 '윤보선 하면 낡은 정치인, 늙은 정치인이 연상되어서 신선한 맛을 느낄수 없었다[150]'고 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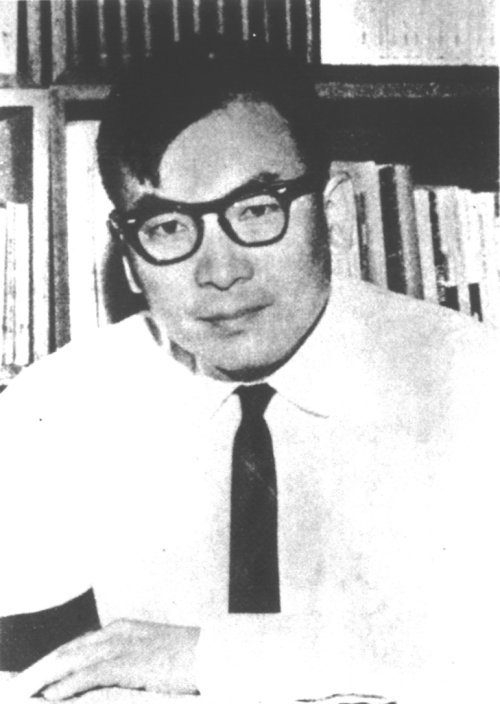
(그는 5대 대선 이후부터 시종일관 윤보선을 지지했으나, 윤보선은 그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6대 대선 유세기간 중 야당의 후보였던 그는 '지난 농사 망친 황소 올 봄에는 갈아보자'며 여당 후보 박정희를 정면으로 공격했다.[153] 윤보선은 선거 유세 중에 월남전 파병을 미국의 '청부 전쟁'이라고 비판했다.[152] 박정희와 공화당은 윤보선의 집안을 친일파 가문이라 공격하였고, 윤보선은 박정희와 공화당으로부터 친일파로 공격받은 것에 분노하였다. 윤보선을 지지하던 장준하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 우리 독립 광복군의 총부리를 겨누었다"라면서 박정희의 친일 경력 의혹을 쟁점으로 꺼냈다.[152] 윤보선은 박정희가 일본군에서 근무한 경력을 들어 다시 공격했다. 윤보선을 지지하던 장준하는 선거기간 중 박정희의 일본군 경력을 예를 들며 공격했다. 윤보선과 민주당은 박정희를 향해 친일파에 공산주의자 경력까지 있으며, 히틀러 등도 긍정적으로 보는 박정희의 사상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공격하였다.
6·3 세대로, 저명한 교수 한 분은 "유세기간 중 경제 정책을 발표할 때 윤보선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가서 어떻게든 원조를 더 받아와 나라살림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산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한일회담 때문에) 박정희는 미웠지만 그의 말은 전율할 만큼 감동으로 다가 왔다. 박정희를 지지하게 되었다[154]"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윤보선은 박정희의 자립책이 비현실적임을 지적, 미국, 일본과 교류 없이 문을 닫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6대 대선에서도 박정희의 공산주의사상과 남로당 경력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었다. 박정희의 사상을 의심하는 의혹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선거는 윤보선에게 유리해 보였으나 그해 5월 대선에서 박정희에게 116만 표 차이로 패하여 낙선했다.[155] 박정희는 농어민과 영세민의 지지를 얻은 한편 윤보선은 도시와 지식인층의 지지를 받았다. 윤보선의 지지 지역은 수도권과 도심지역이었고, 박정희의 지지 지역은 농촌과 산촌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후 장준하와 함께 베트남 파병을 반대하였다.[156] 당시에 다른 이들도 베트남 파병을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윤보선과 장준하는 특히 베트남 전쟁 파병을 맹렬히 비난했다.[156] 윤보선과 장준하는 박정희의 월남파병 강행은 국익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의 피를 파는 매국행위이며, 국민적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기만술이라며 비판을 가한다.
2. 6. 2. 1970년대 민주화 운동 참여
1970년대 윤보선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76년 3월 1일 김대중 등과 함께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9] 1978년 2월 24일 함석헌과 함께 66명이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했다.[10] 이는 정부로부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불법 활동"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 판결을 받았다.반유신 운동의 해외 홍보를 위해 해외 인사들과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1978년 윤보선은 일본에 체류 중인 정경모를 통해 국민연합 일본지부를 세우려 했으나, 문익환은 '아직도 그의 사상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173] 김재준 목사가 정경모를 강력히 추천했지만 문익환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173] 결국 문익환의 반대로 국민연합 일본지부 결성 계획은 취소되었다.
같은 해 10월 17일 윤보선은 함석헌, 문익환 등 야당 및 재야인사 402명과 12개의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10·17 민주국민선언을 발표했다. 1978년 12월 7일에는 민주주의 국민연합과 함께 '12ㆍ12 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국민연합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으로 개편되면서 윤보선은 함석헌, 김대중과 함께 공동 의장으로 선출되었다.[174] 3월 4일 안국동 사저에서 함석헌, 김대중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3.1절 성명을 발표했다.[162][174] 1979년 5월 신민당 총재상임고문이 되었지만,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했다.
김영삼 제명 파동 소식을 듣고 독재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한다며 박정희를 비판했다. 10월 26일 안국동 사저에서 박정희의 피격 사망 소식을 접했다. 1979년 YMCA 위장 결혼식 사건에도 참여했다.
2. 7. 생애 후반 (1979~1990)
1980년 정계에서 은퇴한 윤보선은 1990년 사망할 때까지 문화 활동에 전념했다.제5공화국 출범 이후 윤보선은 박정희 정부 시절과는 달리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국정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였다.[177] 1980년 초 전두환과 신군부는 안국동 윤보선 자택을 방문, 면담하였다. 전두환 등은 윤보선에게 박정희 정권의 부패상을 지적하며 자신들은 박정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다.[177] 오랫동안 박정희에게 핍박받고 기약 없는 민주화 운동으로 지친 윤보선은 국정자문회의 의원직을 수락했다.[177]
윤보선의 부인 공덕귀는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을 말렸지만, 윤보선은 국정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177] 그는 전두환의 독재에 협력하였다며 학생운동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또한, 윤보선은 학생운동가들의 반미주의적인 활동은 야당 운동, 학생 운동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보선은 공산주의 혁명론, 민족 해방론, 반미주의 사상을 가진 운동권을 극도로 불신하였다. 강원용은 '윤보선씨는 그처럼 위험한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바에는 박정희처럼 장기 집권만 안 한다면 당분간 군인들에게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해요.[178]'라고 지적했다.
1981년 4월 23일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재선되었다. 1984년, 민청학련에 연루되었던 윤보선은 전두환에게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사면복권을 요청, 198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복권조치가 있었다.[179] 전두환은 윤보선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윤보선은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시키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179] 윤보선의 부인 공덕귀 역시 관련자 사면복권에 활약하였다.[179] 한편 1980년대 중반 일부 학생운동가들의 반미 시위에,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운동이 실패할 것이라며 반미주의에는 반대하였다.
1985년 6월 제4회 전국사회복지대회준비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회 명예회장직에 선임되었다. 같은 해 3월 경희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학위와 12월 미국 US 국제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민족사바로잡기국민회의 의장이 되었다.
1987년 6월 22일 윤보선은 전두환에게 6.10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라는 충고를 담은 메모를 보냈다. 또한 강원룡, 신현확 등의 개신교 인사와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을 추천, 이들의 말을 듣고 시위대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를 지지했고[65], 12월 14일에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를 지지했다. 윤보선의 노태우 공개 지지 선언은 김영삼, 김대중의 후보단일화 실패, 김대중의 평민당 창당과 함께 학생운동가들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강원룡, 김수환 등의 강연회와 기독교단체 운동에 적극 후원, 참여하기도 했다.
윤보선은 만년에 양복 한 벌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 양복은 어려운 중에 있던 자신을 찾아준 것을 감사히 여긴 디자이너 이정송이 재단해준 것이었다.[180] 1970년대 중반부터 당뇨로 고생하였는데, 조카 윤남경에 의하면 1975년경부터였다고 한다.
1985년 사회복지협회 명예회장, 1988년 윤관 장군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에 추대되었다. 그 후 건강이 악화되어 1988년 5월 잠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병세가 악화, 1989년 석오 이동녕 기념사업회 회장에 선임되었으나, 같은 해 5월 14일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에 폐렴까지 겹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 후에 안정을 되찾아 자택에서 요양했으나 급성 신부전증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1990년 3월 말 다시 노환으로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투병하다가, 7월 초 병환에 차도가 없자 퇴원, 임종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자택으로 옮겨졌다.
1990년 7월 18일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자택에서 서거하였다. 장례는 가족장(家族葬)으로 진행되었으며,[181][182]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 34-2에 위치한 가족묘에 5대조·부모 묘 근처에 안장되었다. 그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의견에 대해 독재자와 함께 누울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한다. 상훈으로 '인촌문화상'을 수여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향년 92세였다.
2. 7. 1. 최규하 정부 시절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윤보선은 이를 인과응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기대하며 김영삼, 김대중에게 야당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으나 결렬되었다. 윤보선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유신 철폐와 민주적 선거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묵살당했다.이후 윤보선은 함석헌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규탄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군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YMCA 위장 결혼식을 열어 정부를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윤보선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164] 고령으로 인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95]
1980년 2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은 국정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윤보선을 의원으로 위촉했으며, 윤보선은 곧 국정자문회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2월 28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윤보선, 김대중 등 687명이 복권되었다.[175]
서울의 봄 당시 윤보선은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화합과 단결을 촉구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대권 욕심에 이를 거부하여 실패했다.[176] 윤보선은 다시 한번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후 정계를 은퇴했다.
2. 7. 2. 전두환 정부 시절과 만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윤보선은 박정희 정부 시절과는 달리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국정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였다.[177] 1980년 초 전두환과 신군부는 안국동 윤보선 자택을 방문, 면담하였다. 전두환 등은 윤보선에게 박정희 정권의 부패상을 지적하며 자신들은 박정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다.[177] 오랫동안 박정희에게 핍박받고 기약 없는 민주화 운동으로 지친 윤보선은 국정자문회의 의원직을 수락했다.[177]윤보선의 부인 공덕귀는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을 말렸지만, 윤보선은 국정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177] 그는 전두환의 독재에 협력하였다며 학생운동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또한, 윤보선은 학생운동가들의 반미주의적인 활동은 야당 운동, 학생 운동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보선은 공산주의 혁명론, 민족 해방론, 반미주의 사상을 가진 운동권을 극도로 불신하였다. 강원용은 '윤보선씨는 그처럼 위험한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바에는 박정희처럼 장기 집권만 안 한다면 당분간 군인들에게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듯해요.[178]'라고 지적했다.
1981년 4월 23일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재선되었다. 1984년, 민청학련에 연루되었던 윤보선은 전두환에게 민청학련 관련자들의 사면복권을 요청, 198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복권조치가 있었다.[179] 전두환은 윤보선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윤보선은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시키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179] 윤보선의 부인 공덕귀 역시 관련자 사면복권에 활약하였다.[179] 한편 1980년대 중반 일부 학생운동가들의 반미 시위에,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운동이 실패할 것이라며 반미주의에는 반대하였다.
1985년 6월 제4회 전국사회복지대회준비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회 명예회장직에 선임되었다. 1985년 3월 경희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학위와 12월 미국 US 국제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민족사바로잡기국민회의 의장이 되었다.
1987년 6월 22일 윤보선은 전두환에게 6.10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라는 충고를 담은 메모를 보냈다. 또한 강원룡, 신현확 등의 개신교 인사와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을 추천, 이들의 말을 듣고 시위대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하였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를 지지했고[65], 1987년 12월 14일에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를 지지했다. 윤보선의 노태우 공개 지지 선언은 김영삼, 김대중의 후보단일화 실패, 김대중의 평민당 창당과 함께 학생운동가들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강원룡, 김수환 등의 강연회와 기독교단체 운동에 적극 후원, 참여하기도 했다.
2. 7. 3. 사망
윤보선은 만년에 양복 한 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 양복은 어려운 중에 있던 자신을 찾아준 것을 감사히 여긴 디자이너 이정송이 재단해준 것이었다.[180] 1970년대 중반부터 당뇨로 고생하였는데, 조카 윤남경에 의하면 1975년경부터였다고 한다.1985년 사회복지협회 명예회장, 1988년 윤관 장군 기념사업회 명예회장에 추대되었다. 그 후 건강이 악화되어 1988년 5월 잠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병세가 악화, 1989년 석오 이동녕 기념사업회 회장에 선임되었으나, 같은 해 5월 14일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에 폐렴까지 겹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 후에 안정을 되찾아 자택에서 요양했으나 급성 신부전증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1990년 3월 말 다시 노환으로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투병하다가, 7월 초 병환에 차도가 없자 퇴원, 임종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자택으로 옮겨졌다.
1990년 7월 18일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자택에서 서거하였다. 장례는 가족장(家族葬)으로 진행되었으며,[181][182]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산 34-2에 위치한 가족묘에 5대조·부모 묘 근처에 안장되었다. 그는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의견에 대해 독재자와 함께 누울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한다. 상훈으로 '인촌문화상'을 수여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향년 92세였다.
3. 평가
윤보선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고집이 세다는 평가와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공존한다.[5]
윤보선은 1975년 “역사교과서 파동”이라는 단체를 통해, 1986년에는 “민족사를 바로잡는 국민회의” 회장으로서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한사군을 조선의 역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11][12] 국사편찬위원회가 기존의 정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을 거부하자, 윤보선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12]
그러나 이기백, 이기동 등 역사학자들은 윤보선의 주장이 학문적 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11][12]
3. 1. 긍정적 평가
윤보선은 민주주의를 물과 공기처럼 보편적인 가치로 여겼으며, 민족적 민주주의나 한국적 민주주의와 같은 변형된 형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 합리적인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190]매사에 상식을 강조하여, 영국이 헌법 없이 상식에 기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예로 들며, 상식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190]
국익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1962년 군사정권 시절, 미국의 잉여농산물 무상 지원을 위해 야당 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김병로는 반대했지만 윤보선은 장택상과 함께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국민의 식량 문제인 만큼 하루빨리 미국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91]
박정희 집권 기간 동안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박정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점을 높이 평가받는다.[113][22] 박정희 정권의 경제 정책 기초를 마련한 점,[104] 인혁당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복권 운동을 벌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경제개발 계획은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어져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104] 논리적이고 사리가 밝은 인물이었다는 평가도 있다.[206]
비서관이었던 김준하는 윤보선을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평가하며, '상식이 곧 헌법'이라며 매사를 상식에 따라 결정하고, 한번 결정한 일은 강직하게 밀고 나갔다고 회상했다. 또한, 윤보선은 지극한 효자로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노모의 안부를 챙겼다고 한다.
1986년에는 "민족사를 바로잡는 국민회의" 회장을 역임했다.[5] 1975년에는 "역사교과서 파동"이라는 단체를 통해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한사군을 한국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12] 이러한 주장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이기백, 이기동 등 역사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11][12]
3. 2. 부정적 평가
윤보선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강했다. 강원룡에 의하면 윤보선은 박정희 반대운동을 했지만, 사상적으로는 뿌리깊은 반공주의자였다. 강원용은 윤보선이 박정희가 무너질 때까지 재야 인사들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했지만, 내심 이들의 행태를 안심할 수 없어했으며, 소위 운동권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전두환 정권을 멀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178] 강원용은 오히려 박정희가 좌익이며 위험 인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때 이범석과 가깝게 지냈던 김정례와도 가까이 지냈다.[178]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고 군부에 정권을 넘겨주었던 나약한 정치인으로 그려지기도 한다.[22] 한영우는 5.16 군사정변 당시 그의 묵인적 행동을 지적하며, 그를 한국 보수 야당의 구파 계열을 대표하는 한 파벌의 정치인일 뿐이라고 평가했다.[40]
친일파 집안 출신으로 어렵지 않게 학창시절을 보낸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197] 그가 친일파라는 비난도 있으나, 직접적인 친일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친일파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윤보선은 자유주의자였지만 현실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원칙론만 되풀이했다는 비판도 있다.[202]
정대철은 윤보선이 내심 5·16 쿠데타를 지지했지만, 겉으로는 지지성명 요구를 거부하는 등 반대 기록을 남겼다며 노회한 정치인의 처세라고 평가했다.[97] 5·16 군사 정변을 방조, 묵인했다는 의혹과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중석은 민주당 신파의 지도자였던 장면 국무총리가 일을 못하게 된 큰 이유가 윤보선이 딴지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113]
4.19 혁명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내각 수반이었던 허정은 윤보선이 장면 정부와 운명을 같이하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었다고 비판했다.[96] 허정은 윤보선이 혁명정권과 한동안 같이 일한 만큼, 혁명 세력과 대결하는 야당 대열에 복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198]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매카시즘 공세를 일으키다가 되려 역공세를 당했다는 비판도 있다.[199] 한국 전쟁 당시 '빨갱이 파문'과 '연좌제'로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윤보선의 매카시즘 대선 전략은 과거의 상처를 되살렸고, 이들은 '박정희가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린다'는 동정심을 가져 박정희에게 지지표를 쏟았다.[200] 결국 박정희는 15만표차로 당선[201] 되었는데, 여기에는 윤보선의 '매카시즘 공략'이 큰 역할을 했다.[199]
6대 대선 당시 윤보선은 민중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고집하여 야당의 분열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있다.[202] 7대 대선에서도 출마하였으나 후보사퇴를 피하려고 박기출에게 양보한 점 역시 비판받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박정희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숙부 윤치영에게 수인사나 목례도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윤보선은 이승만의 권위주의와 박정희의 권위주의적인 행동에 대해 권위주의, 전체주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신방학과 교수 강준만에 의하면 윤보선도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강준만은 "권위주의적인 윤보선과 다툼을 싫어하는 장면의 대조적인 성격"이라고 비평하기도 했다.[203] 강준만은 그를 '명문가라는 자존심과 더불어 양반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으며[204]',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었다.[204]'고 평하였다.
윤보선 본인은 5·16 군사정변을 승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2공화국의 국가원수임에도 5·16 군사정변을 추인 내지는 저지하지 않았다는 비판론이 있다. 더 나가 학생혁명만 혁명이고 군사혁명은 혁명이 아니냐고 항의했다고도 한다. 그가 5·16 군사 정변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주장 외에 지지는 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5.16 군사 정변이 터지자 그는 1군사령관 이한림 1군단장 임부택 등에게 비서관들을 보내 "국군 끼리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면서 진압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도 있다. 장면은 윤보선이 1군 사령관 이한림에게 자신의 비서관들을 보내 진압을 만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군사정변 당시 장면의 포기로 사실상 국군통수권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38선 전방부대를 서울로 보내 군사 정변을 저지하지 않았고, 박정희의 국군통수권 이양 요구 당시 '''"올 것이 왔다"'''라는 말과 함께 순순히 국군통수권을 이양한 것 때문에 그가 군사정변을 묵인하는 대신 박정희와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매개체로 타협을 보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학자들이 있다.
윤보선의 정변 방조 의혹은 1962년 5월 유원식이 제기하였다. 유원식은 인터뷰에서 '윤보선이 이전부터 쿠데타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고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하자, 윤보선은 이를 부인하며 '혼란한 장면 정부하에서 무슨 사태가 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났다기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208] 그러나 윤보선은 자신의 회고록인 《외로운 선택의 나날들:윤보선 회고록》에서 유원식과는 만난 적이 없으며, 유원식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윤보선은 내각책임제 하에 정부 수반으로서 실권을 행사했던 장면 총리의 실권을 부러워하여 5·16 군사정변을 방조 내지는 묵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원수 신분으로서 정치적 라이벌인 장면의 몰락을 바라며 제2공화국 붕괴를 방관했다는 이러한 주장은, 야당 지도자로 활동 중이었던 윤보선에게는 도덕적으로 치명적이었다. 윤보선 측은 5·16 군사정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여, 유원식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214]
그러나 김도연으로부터 폭동발생, 정변 음모 등의 정보를 입수하고, 김도연에게서 들은 정보를 국무총리 장면에게 알려 철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는 증언도 있다.[209] 그러나 장면은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 알아보니 별일이 아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반응했다고 한다.[209]
장면은 윤보선이 비서관들을 보내 쿠데타 진압을 저지시켰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장면은 윤보선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1군 사령관 이한림에게 보내서 쿠데타 진압을 저지하도록 했다[210]는 것이다. '국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한 것을 알고는 쿠데타가 진압되리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210]'는 것이 장면의 주장이다.
"올 것이 왔다"는 발언에 대하여 유원식도 같은 진술을 했다. 후에 유원식이 5·16 군사정변 직전에 대통령 윤보선과 만나 정변 계획에 대한 교감을 나누었으며 정변 소식을 들은 윤보선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214][215]
"올 것이 왔구나"를 둘러싼 논쟁은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고, 윤보선이 죽을 때까지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40]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비서관을 지냈던 김준하에 의하면 그는 5·16 군사 정변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김준하에 의하면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내통하거나 묵인한 일은 결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이 없었던 윤 대통령은 마셜 그린 주한 미 대사와 카터 매그루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미군을 동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피를 흘리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고 덧붙였다. 김씨는“정치군인들의 치밀한 사전계획과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분열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 집권에 성공했다' 고 증언하였다.[216]
또한 그가 5·16 군사 정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거나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지 않았던 점도 있어 그를 협력자라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고집이 세다는 평가와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있다.
1986년에는 “민족사를 바로잡는 국민회의” 회장을 역임했다.[5] 1975년에는 “역사교과서 파동”이라는 역사 단체를 결성하여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강조하자”, “한사군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조선의 역사에서 제외하자”는 운동을 일으켜 한국의 역사학계를 식민사관이라고 비난·공격했다.[11][12] 국사편찬위원회가 기존의 정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을 거부하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2] 이기백은 “학문의 진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면, ‘역사교과서 파동’은 심각한 문제를 역사학자들에게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단군 문제였는데, 단군에 관한 전승을 신화로 만들지 말라고 역사학자들을 공격하고, 왜 학생들에게 단군을 신화라고 가르치는가 비난했습니다.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12] 이기동은 “1980년대에 ‘역사교과서 파동’이라는 운동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 말기였지만, 윤보선 전 대통령을 총재로 내세운 극우단체가 주도했고, 한국 정부가 국사교육심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나는 참여했었기에 잘 알고 있다. 이들은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강조하자’, ‘한사군은 부끄러운 일이므로 조선의 역사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에서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부대 의견을 붙였다. 그런데 최근 다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의 상고사와 고대사의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그들의 논리와 같다.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11]
3. 3. 종합적 평가
윤보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명문가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다.[189] 그는 양반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었다.[205] 그의 정치관은 흑백논리에 기반하여 타협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189]4·19 혁명 당시 자유당 의원들에게 "이 사태를 단순한 데모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80] 그러나 자유당은 윤보선이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비난했다.[81]
영국 유학 시절, 영수증을 주고받지 않는 문화에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부도덕성과 비정직성을 비판했다.[194][195] 그는 한국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정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희와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정책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으며, 국민들의 의식 개혁과 정신 혁명을 강조했다.
그는 한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각별하게 챙기는 자상함을 보였지만, 냉정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206] 서중석은 윤보선이 4·19 혁명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후 장면 국무총리와 대립하면서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113] 또한 박정희와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113]
고집이 세고 원칙주의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깔끔한 신사였다는 평가도 있다.
1975년과 1986년에는 "역사교과서 파동"이라는 운동과 “민족사를 바로잡는 국민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한사군을 조선의 역사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펼쳤다.[5][11][12] 이는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기백, 이기동 등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학문적 진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12][11]
4. 가족 관계
- 사돈: 신규식(申圭植, 1880년 음력 1월 13일~1922년 양력 9월 25일)
- 사돈: 조정완
- 사돈: 신명호(申明浩)[231]
- 사돈: 민필호(閔弼鎬, 1898년 2월 7일~1963년 4월 14일, 독립운동가, 사위 신준호의 매부)
- 사돈: 남궁억(南宮檍, 1863년 12월 27일~1939년 4월 5일) - 6촌 형 윤광선의 장인
- 사돈: 민영철(閔泳喆, 1864년~1912년) - 큰아버지 윤치오의 딸 윤시선의 시아버지이자 본처 민씨의 친정아버지, 민영환의 6촌 동생
- 사돈: 현진건(玄鎭健, 1900년 8월 9일~ 1943년 4월 25일) - 8촌 매형 현정건의 동생이며, 큰아버지 윤치오의 후처 현송자의 6촌 동생
- 사돈: 손정도(孫貞道, 1872년 7월 26일~1931년 2월 19일) - 당숙 윤치창의 장인
- 사돈: 손원일(孫元一, 1909년 5월 5일~1980년 2월 15일) - 당숙 윤치창의 처남
- 사돈: 방일영(方一榮, 1923년 11월 26일~2003년 8월 8일) - 6촌 형 윤영선의 손녀사위 방상훈의 아버지
- 사돈: 방응모(方應謨, 1883년 9월 29일~1950년 8월)
그의 둘째딸은 그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인 신규식의 장남과 결혼하여, 스승 신규식과는 사돈간이 된다. 또한 독립운동가 민필호, 신명호, 김준엽은 사위 신준호를 통해 인척관계를 형성한다. 음악가 겸 방송인 남궁연은 그의 동생 윤완선의 외손자였다.
5. 기타
서울 안국동에 있는 고택인 안국동 윤보선가는 대한민국 국가지정문화재이다.[18] 윤보선은 사망 몇 달 전 이곳에서 절도 사건을 당해 골동품 38점(시가 9000만원 이상)을 도난당했다.[16]
참조
[1]
논문
The Japan-Korea Normalization Process and Korean Anti-Americanism
[2]
뉴스
Yun Po Sun, 92, Dies; Ex-President of Korea
https://www.nytimes.[...]
1990-07-19
[3]
메모
The Kim Seong-su Memoriam
[4]
뉴스
今日の歴史(8月12日)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09-08-12
[5]
웹사이트
윤보선(尹潽善)
http://encykorea.aks[...]
2022-08-09
[6]
웹사이트
역대 대한축구협회장 명단(이 기사는 表임)
https://sports.news.[...]
2009-01-22
[7]
텍스트
[8]
텍스트
[9]
서적
韓国民主化への道
岩波新書
[10]
뉴스
今日の歴史(2月24日)
http://japanese.yonh[...]
聯合ニュース
2009-02-24
[11]
뉴스
“검인정교과서 실체는 민중사학의 비틀린 허위의식”
https://www.donga.co[...]
2015-12
[12]
뉴스
역사학계의 식민사학 비판 우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https://www.mk.co.kr[...]
2017-07-24
[13]
웹사이트
윤치소(尹致昭)
http://people.aks.ac[...]
2023-10-28
[14]
웹사이트
대통령·장관·서울대총장…대이어 ‘지배 엘리트’
https://www.hani.co.[...]
2009-08-14
[15]
웹사이트
'3·1운동도 비난'…문창극이 옹호한 '친일파' 윤치호
https://www.nocutnew[...]
2014-06-16
[16]
웹사이트
尹潽善(윤보선)씨 집 도둑 골동품 9천만원어치 훔쳐
https://newslibrary.[...]
1990-02-10
[17]
웹사이트
윤인구 전두환, 19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질길 수 밖에 없는 인연
https://vop.co.kr/A0[...]
2012-06-06
[18]
웹사이트
사적 안국동 윤보선가 (安國洞 尹潽善家) :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
2023-10-28
[19]
웹사이트
대통령열전2 : 제4대 대통령 윤보선
http://www.everynews[...]
[20]
기타
[21]
뉴스
대통령·장관·서울대총장…대이어 '지배 엘리트'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08-14
[22]
서적
한국사 인물 열전
돌베개
[23]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24]
서적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25]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26]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27]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28]
서적
매천야록
두산동아
[29]
웹사이트
윤보선 - Daum 백과사전
http://enc.daum.net/[...]
[30]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31]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32]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33]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34]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35]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36]
서적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37]
서적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38]
기타
[39]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0]
서적
한국사 인물 열전
돌베개
[41]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2]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3]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4]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5]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6]
간행물
역사비평:1992 여름호
역사비평사
[47]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8]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49]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50]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51]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52]
서적
민주당 결성과 윤보선의 리더십 연구: 1960년대 초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53]
웹인용
서울특별시 역대 시장
http://www.seoul.go.[...]
2010-12-30
[54]
웹사이트
윤보선 前대통령 부귀한 자손임에도 검소한 생활 건강한 웃음 푸른 희망 - 스포츠월드
http://sportsworldi.[...]
[55]
서적
아! 비운의 역사현장 경교장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56]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57]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58]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59]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60]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61]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62]
기타
[63]
서적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64]
서적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65]
웹사이트
http://www.seoul.co.[...]
[66]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67]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68]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69]
서적
외로운 선택의 나날
동아일보사
[70]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71]
서적
외로운 선택의 나날
동아일보사
[72]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73]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74]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75]
서적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76]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77]
웹사이트
방대한자료·증언 바탕 제2공화국 긍정적 평가
http://www.munhwa.co[...]
[78]
서적
외로운 선택의 나날
동아일보사
[79]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80]
서적
외로운 선택의 나날
동아일보사
[81]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82]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
인물과사상사
[83]
웹인용
의원직 사퇴코 탈당 윤 대통령 13일 굴출
https://newslibrary.[...]
2019-09-04
[84]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
인물과사상사
[85]
웹사이트
대전일보 60주년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http://www.daejonilb[...]
[86]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
인물과사상사
[87]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88]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
인물과사상사
[89]
서적
제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90]
뉴스
제2공화국과 장면:윤보선과의 갈등(중)
대한매일
1999-03-19
[91]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
인물과사상사
[92]
서적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나남
[93]
서적
제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94]
서적
제2공화국과 장면
범우사
[95]
서적
한국사 인물 열전
돌베개
[96]
서적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사
[97]
서적
장면은 왜 수녀원에 숨어 있었나
동아일보사
[98]
서적
장면은 왜 수녀원에 숨어 있었나
동아일보사
[99]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100]
서적
곡필로 본 해방 50년
한울
[101]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102]
서적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
[103]
서적
한국정치 100년을 말한다: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한국 정치의 실상
두산동아
[104]
웹사이트
윤보선 정부의 경제정책 틀이 `한강의 기적` 밑거름
http://news.mk.co.kr[...]
2009-08-07
[105]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106]
서적
신봉승의 조선사 나들이
도서출판 답게
1996
[107]
서적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7
[108]
서적
영시의 횃불-박정희대통령 따라 7년
한림출판사
1966
[109]
서적
초근목피에서 선진국으로의 증언
한국경제신문사
2006
[110]
서적
영시의 횃불-박정희대통령 따라 7년
한림출판사
1966
[111]
서적
영시의 횃불-박정희대통령 따라 7년
한림출판사
1966
[112]
서적
한국정치론
오름
2004
[113]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14]
기타
[115]
서적
파벌로 보는 한국야당사
에디터
2006
[116]
서적
비록 박정희 시대 (1)
중원문화사
1984
[117]
서적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7
[118]
서적
그해 5월 3
한길사
2006
[119]
서적
그해 5월 3
한길사
2006
[120]
뉴스
경향신문
1963-09-28
[121]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22]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23]
기타
[124]
서적
그해 5월 3
한길사
2006
[125]
서적
파벌로 보는 한국야당사
에디터
2006
[126]
서적
비록 박정희 시대 (1)
중원문화사
1984
[127]
서적
비록 박정희 시대 (1)
중원문화사
1984
[128]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29]
서적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7
[130]
서적
역사비평:1992 여름호
역사비평사
2007
[131]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32]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33]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34]
웹사이트
김형욱 ‘대통령 지면 윤보선 암살’ 명령
http://www.hani.co.k[...]
2010-10-25
[135]
웹사이트
‘윤보선을 암살하라’
http://www.ilyoseoul[...]
2004-02-13
[136]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37]
서적
외로운 선택의 나날들:윤보선회고록
동아일보사
1991
[138]
서적
대한민국 건국과 나:창랑 장택상 자서전
창랑장택상기념사업회
1992
[139]
서적
외로운 선택의 나날들:윤보선회고록
동아일보사
1991
[140]
웹사이트
〈그때 그 사건〉‘빈둥 발언’은 자아비판인가
http://newsmaker.kha[...]
2007-03-13
[141]
웹사이트
철없는 학생들과 위선적 지식인
http://monthly.chosu[...]
[142]
뉴스
한일회담 의견 교환 윤·그린
동아일보
1965-05-01
[143]
서적
한국야당사
백산서당
1987
[144]
서적
한국야당사
백산서당
1987
[145]
서적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146]
웹사이트
[강원용 목사의 체험 한국 현대사 ④] 12·12 직후 만난 DJ, “군인들은 내게 충성할 것”1
http://shindonga.don[...]
2013-09-29
[147]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48]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49]
기타
[150]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51]
서적
역사의 언덕에서 3:Between and Beyond
한길사
2003
[152]
서적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153]
웹사이트
한국 선거 60년-'황소'부터 '경제'까지
http://www.mt.co.kr/[...]
[154]
웹사이트
http://www.seoul.co.[...]
[155]
기타
[156]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157]
서적
역사비평:1991년 겨울호
역사비평사
1991
[158]
서적
역사의 언덕에서 3:Between and Beyond
한길사
2003
[159]
웹사이트
[강원용 목사의 체험 한국 현대사 ④] 12·12 직후 만난 DJ, “군인들은 내게 충성할 것”3
http://shindonga.don[...]
2013-09-29
[160]
웹사이트
http://media.daum.ne[...]
[161]
웹사이트
http://media.daum.ne[...]
[162]
웹인용
¾¾¾ËÀç´Ü
http://www.crlife.or[...]
2010-02-12
[163]
웹사이트
[길을찾아서] 인혁당 가족 돕자 시작된 미행과 도청 / 문정현
http://www.hani.co.k[...]
[164]
뉴스
(盧소환) 前대통령 수난史 '초대~16대'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9-04-30
[165]
서적
윤보선회고록:외로운 선택의 나날들
동아일보사
1991
[166]
서적
윤보선회고록:외로운 선택의 나날들
동아일보사
1991
[167]
서적
윤보선회고록:외로운 선택의 나날들
동아일보사
1991
[168]
서적
윤보선회고록:외로운 선택의 나날들
동아일보사
1991
[169]
간행물
비록 한국의 대통령
조선일보사
1993
[170]
웹사이트
술김에 “무식한 박정희”말했다 징역2년
https://news.naver.c[...]
[171]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justice.o[...]
2010-02-12
[172]
웹사이트
나도 한때는 '정조'를 파는 창부였다. 그러나 난 더이상의 창부이길 거부했다
http://www.ohmynews.[...]
[173]
서적
문익환 평전:역사인물찾기 15
실천문학사
2004
[174]
웹인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주의
http://www.kdemocrac[...]
2010-02-12
[175]
서적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
[176]
서적
한국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177]
서적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황금가지
[178]
웹인용
[강원용 목사의 체험 한국 현대사 ④] 12·12 직후 만난 DJ, “군인들은 내게 충성할 것” 4
http://shindonga.don[...]
2013-04-30
[179]
서적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180]
서적
나 그들과 함께 있었네
여성신문사
[181]
뉴스
국민장 치를지 가족장 치를지 유족과 논의해 결정
http://news.donga.co[...]
donga.com
[182]
뉴스
역대 대통령 장례식 어떻게 치러졌나?
http://www.newsen.co[...]
뉴스엔
[183]
서적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황금가지
[184]
뉴스
故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개관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12-16
[185]
뉴스
윤보선 전 대통령 기념전시관 건립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186]
뉴스
[사람과 이야기] 아산에 '윤보선 기념관' 19일 문열어
http://news.chosun.c[...]
조선닷컴
[187]
뉴스
동아일보
1972-06-26
[188]
기타
[189]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190]
서적
대통령과 장군-숙명의 대결,쿠데타에서 사상논쟁까지
나남출판
[191]
서적
대한민국 건국과 나
창랑장택상 기념사업회
[192]
서적
대한민국 건국과 나
창랑장택상 기념사업회
[193]
서적
대한민국 건국과 나
창랑장택상 기념사업회
[194]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195]
서적
구국의 가시밭길
한국정경사
[196]
서적
한국의 퍼스트 레이디
황금가지
[197]
기타
[198]
서적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사
[199]
웹인용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ttp://tvpot.daum.ne[...]
2011-05-03
[200]
웹인용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ttp://tvpot.daum.ne[...]
[201]
기타
[202]
서적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203]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4]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5]
서적
한국 대통령 8인 비극적 말로의 비밀
사람의향기
[206]
서적
자존심을 지킨 한 조선인의 회상:한·미·일 3국인의 삶을 산 최기일 박사 자서전
생각의나무
[207]
서적
WWW.한국현대사.COM
민연
[208]
웹사이트
신동아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9]
웹사이트
신동아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10]
서적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211]
서적
장면은 왜 수녀원에 숨어 있었나
동아일보사
1997
[212]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1
인물과사상사
2006
[213]
서적
장면은 왜 수녀원에 숨어 있었나
동아일보사
1997
[214]
저널
[5·16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40년 만에 털어놓은 군사쿠데타의 숨겨진 진상 5] 장면은 장도영의 이중플레이에 속았다
http://www.donga.com[...]
[215]
저널
유원식 회고록에 할 말 있다
[216]
뉴스
김준하씨 "尹대통령,5·16세력과 내통안했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2-07-09
[217]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
인물과사상사
2006
[218]
서적
격랑 80년:선우종원 회고록
인물연구소
1998
[219]
서적
한국현대사산책:1960년대편 제1권
인물과사상사
2006
[220]
서적
내 운을 살려주는 풍수여행
동아일보사
2008
[221]
뉴스
(춤과 그들) 정무연 ‘춤추는 제비’의 고독한 날개짓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7-12-06
[222]
서적
윤치영의 20세기:동산회고록
삼성출판사
1991
[223]
웹사이트 # 추정
윤치영 회고록
[224]
웹인용
해평윤씨대동보
https://www.familyse[...]
가승미디어
2005
[225]
웹사이트 # 추정
이준용 첩 전순혁
[226]
웹사이트
안동교회 90년사
http://www.andong-ch[...]
[227]
웹사이트 # 추정
윤치영 가족 관계
[228]
뉴스
남흥우(고려대 명예교수)씨 상배 외
http://www.kihoilbo.[...]
기호일보
2007-03-27
[229]
웹인용
고령신씨세보
https://www.familyse[...]
1927
[230]
웹사이트
Photolog, By Ryo
http://ehosun.tistor[...]
[231]
웹사이트 # 추정
신준호 가족 관계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백혜련,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국힘의 계엄 해제 방해 있었다”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 하게 하고 싶었다”
청와대 관람 전면 중단, 대통령실 복귀 준비···누적 관람객 852만명
오늘부터 청와대 관람 전면 중단…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준비
"무덥지만 마지막으로 보러 왔죠"…3년간 852만 명 다녀간 청와대
[속보]내란 특검, 한덕수 주거지 압수수색
김건희 소환 통보 날 '옥중 메시지'…"논박 가치 없다" 웃어넘긴 특검
[표] 외국환율고시표
윤 전 대통령, 수용번호 3617…역대 대통령보다 좁은 2평대 독방 수감 | JTBC 뉴스
[단독] 5분도 아니었다…초단위 CCTV 분석해 '2분 국무회의' 결론 | JTBC 뉴스
이주호 부총리, 내란 특검 '묵묵부답' 출석…계엄 국무회의 조사
[속보] 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1공수여단장 "곽종근, '대통령이 문 부숴서 끄집어내래' 지시"
이재명 "윤 전 대통령, 왕노릇 하려다 계엄…다음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총 쏴서라도" "두 번, 세 번 계엄"…'윤 통화 진술' 증언 나왔다 | JTBC 뉴스
계엄 선포·포고령·국회 방해 등 5대 쟁점 모두 “위헌성 중대”
"비합리적 판단으로 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배"
윤 파면, 탄핵·구속부터 하야까지…반복되는 역대 대통령 수난사
'12·3 계엄의 밤' 재구성…하나하나 따져본 불법과 위헌 | JTBC 뉴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