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공회 39개조 신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영국 성공회 39개조 신조는 16세기 잉글랜드 종교 개혁 시기, 개신교와 가톨릭교회의 중용을 추구하며 캔터베리 대주교 매슈 파커가 작성한 영국 성공회의 신앙 조항이다. 1563년 39개 조항으로 출판되었으며,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등 종교 개혁가들의 저작 영향을 받았다. 39개조 신조는 삼위일체, 성경, 죄와 구원, 교회와 권위, 성례전 등 성공회의 교리를 설명하며, 가톨릭, 칼뱅주의, 재세례파와 관련된 성공회의 입장을 담고 있다. 1662년 공동 기도서와 함께 인쇄되어 성공회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성공회 사상과 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563년 기독교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 프리드리히 3세가 편찬한 기독교 신앙 문답서로, 루터교와 개혁주의의 교리적 차이를 해결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삼위일체, 사도신경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개혁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 1563년 잉글랜드 - 1563년 런던 페스트
1563년 런던 페스트는 엘리자베스 1세 치세에 런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여 런던 봉쇄를 겪고 1564년 초에 종식된 흑사병 유행을 의미한다.
2. 배경
16세기 잉글랜드 왕국은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 간의 종교 분쟁으로 진통을 겪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통일령을 통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중용 (Via Media)을 지키는 균형 잡힌 종교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캔터베리 대주교 매슈 파커가 작성한 영국 성공회 39개 신앙 조항이다.
2. 1. 잉글랜드 종교개혁
16세기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 간의 종교 분쟁으로 진통을 겪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통일령을 통해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중용(Via Media)을 지키는 균형 잡힌 종교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캔터베리 대주교 매슈 파커가 작성한 영국 성공회 39개 신앙 조항이다.2. 2. 39개조 신조의 성립 과정
16세기 잉글랜드 왕국에서는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교회 간의 종교분쟁으로 진통을 겪었다.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는 종교통일령과 함께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중용(Via Media)을 지키는 균형잡힌 종교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캔터베리 대주교 매슈 파커가 작성한 영국 성공회 39개 신앙 조항이다.19세기까지는 성직자와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및 학생에게만 동의 서명을 요구했을 뿐, 그 외에는 강제적인 서명 요구는 없었다. 1865년부터는 영국 성공회 성직자들도 성공회 기도서와 39개 신앙 조항에서 표현한 영국 성공회의 교리가 성서에 부합한다는 것에 동의하면 되었으며, 이전과 같은 동의 서명은 요구되지 않았다.[1]
미국 성공회는 잉글랜드 성공회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에서 잉글랜드적인 상황에 기초한 항목들(제21조, 제36조, 제37조)을 변경하여 1801년에 승인하였다.[2]
에드워드 6세의 즉위로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와 개혁파가 실권을 잡게 되었다. 크랜머는 독일과 스위스의 개혁가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적 공통 신조를 만들려 했으나, 국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나타내는 42개 조항의 작성이 우선시되었다. 42개 조항은 1549년 크랜머가 착수하여 1552년 11월에 완성되었고, 에드워드 6세의 승인을 거쳐 출판되었다.[3]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하고, 가톨릭 신자인 메리 1세가 즉위하자 크랜머 등은 처형되었다. 메리 1세는 캔터베리 대주교에 가톨릭 인물을 앉히고 잉글랜드의 가톨릭 복귀를 꾀했다. 그러나, 메리 1세 사망 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자 매튜 파커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156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주교회의를 소집하고, 파커가 42개 조항의 라틴어판을 회의에 건의했지만, 상원과 하원이 검토하여 39개 조항으로 개정하여 승인되었다. 이렇게 하여, 1563년에 39개 조항이 출판되었다. 1571년의 주교 회의에서는 39개 조항의 영어판이 채택되었다.[4]
39개 조항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뷔르템베르크 신앙 고백, 츠빙글리, 불링거, 칼뱅 등 종교 개혁가들의 저작의 영향을 받았다. 교회 정치론은 에라스투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공동 기도문과 직제에 관해서는 프로테스탄트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5]
3. 39개조 신조 이전의 문서들

영국 종교 개혁 시기,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하면서 교리적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잉글랜드 교회만의 신앙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39개조 신조 이전에 여러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 10개 신조(1536): 헨리 8세 시기, 종교 회의에서 채택된 잉글랜드 교회의 첫 번째 교리 선언문이다. 성경과 보편적 신조, 세례, 고해, 성찬례, 칭의 등 주요 교리를 다루었으며, 연옥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1]
- 주교의 책(1537): 토머스 크롬웰 주도로 소집된 전국 종교 회의에서 출판되었다. 십조항의 내용을 보존하면서 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종부성사 등 네 가지 성사를 추가로 다루었다. 신조, 십계명, 주기도문, 성모송에 대한 해설도 포함되었다.[2]
- 6개 조항(1539): 헨리 8세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화체설, 성직자 독신, 고해성사 등 가톨릭 교리를 재확인했다. 위반 시 가혹한 처벌이 따랐다.[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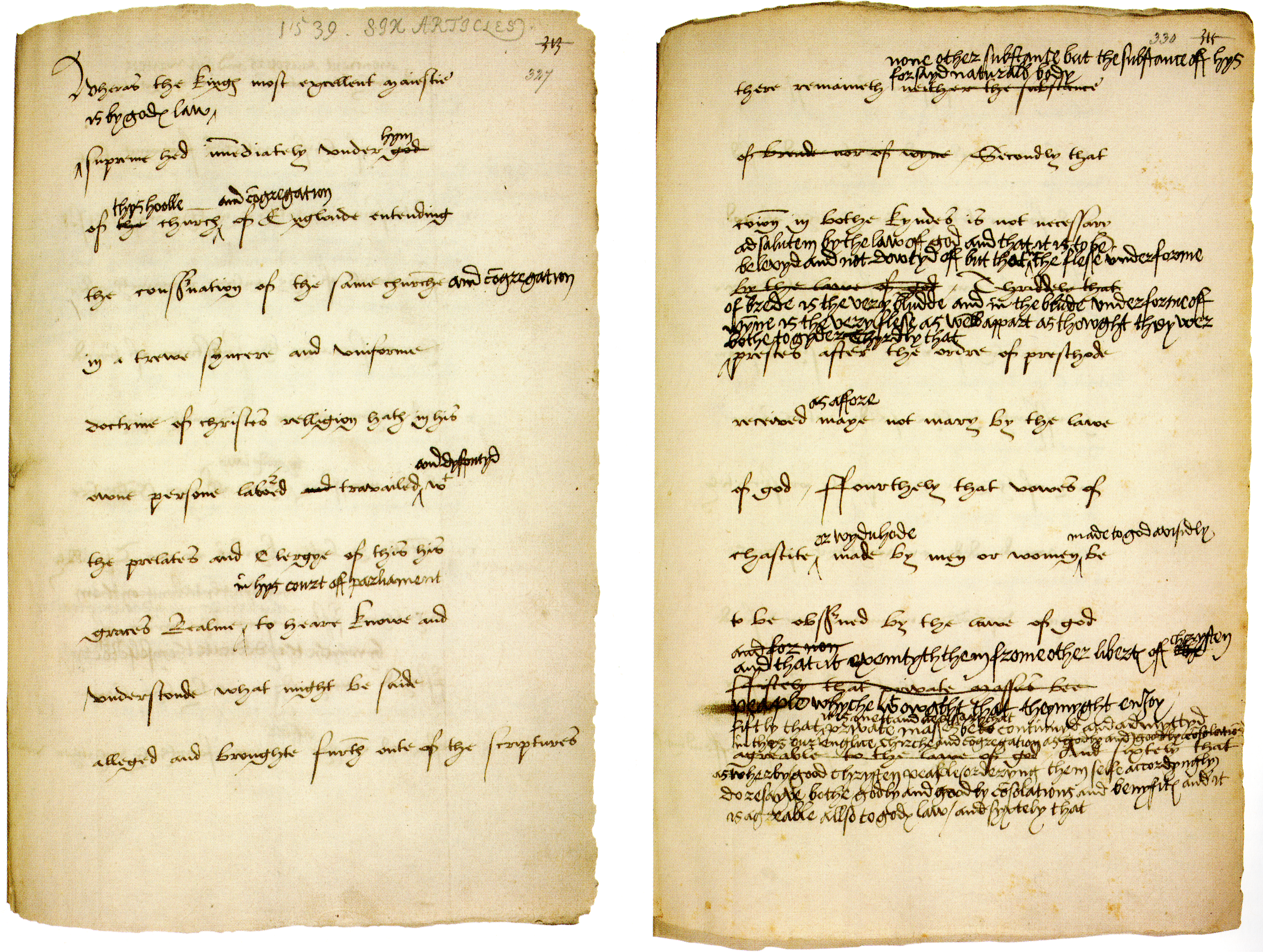
- 왕의 책(1543): 헨리 8세의 지시로 ''주교의 책''을 수정하여 출판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약화시키고, 화체설, 고해성사 등 가톨릭 전통을 옹호했다. 연옥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7]
- 42개 조항(1553): 에드워드 6세 시기, 토머스 크랜머 주도로 작성된 개신교적 신앙 고백이다. 칼뱅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메리 1세 즉위 후 폐지되었다.[8]
3. 1. 10개 조항 (1536)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와 결별하면서 교리의 혼란과 논쟁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보수적인 성직자와 개혁적인 성직자 모두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려 했는데, 전자는 "교황 없는 가톨릭"을, 후자는 프로테스탄트를 지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의 평화와 통일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1536년 7월 성직자 종교 회의에서 10개 조항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잉글랜드 교회의 교황 이후 첫 번째 교리 선언이었다.[1]10개 조항은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급하게 마련된 임시 타협안이었다. 역사가들은 이를 루터교의 승리이자 가톨릭 저항의 성공으로 보기도 하고,[1] "혼란스럽다"고 묘사하기도 했다.[1]
처음 다섯 개 조항은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명령하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교리를 다루었고, 나머지 다섯 개 조항은 "교회에서 사용되는 칭찬할 만한 의식"을 다루었다.[1] 이러한 구분은 이 조항들이 그해 초에 있었던 두 가지 다른 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영한다. 처음 다섯 개 조항은 잉글랜드 대사 에드워드 폭스, 니콜라스 히스, 로버트 반스와 마르틴 루터, 필리프 멜란히톤을 포함한 독일 루터교 신학자들 사이에서 협상된 비텐베르크 조항을 기반으로 했다. 이 교리 선언 자체는 1530년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기반으로 했다.[1]
다섯 가지 주요 교리는 성경과 보편적 신조, 세례, 고해, 성찬례, 그리고 칭의였다.[1] 10개 조항의 핵심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였다.[1] 칭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피와 수난의 공로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약속된, 아버지의 유일한 자비와 은총"을 통해서였다.[1] 선행은 칭의에 앞서지 않고 뒤따른다. 그러나 루터교의 영향력은 수식어로 희석되었다. 칭의는 "통회와 믿음이 자선과 결합됨으로써" 얻어졌다.[1] 다시 말해, 선행은 "영생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였다.[1]
보수파는 전통적인 일곱 가지 성사 중 세례, 성찬례, 고해 세 가지만 언급되었다는 점이 아쉬웠다.[1] 이 조항은 성찬례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확인하며, "빵과 포도주의 형상과 모습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몸과 피가 진실로, 실질적으로, 실제로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1] 이 정의는 화체설 또는 성사적 연합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용 가능했지만, 성사주의는 명백히 비난했다. 개혁가들에게 더 논란이 된 것은, 이 조항이 고해를 성사로 유지하고, 사제가 고백에서 하나님의 사면을 부여할 권한을 유지한 것이었다.[1]
6~10 조항은 부차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세 종교의 중심 관심사였던 연옥이 비필수 조항에 포함되었다. 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개 조항은 모호하게 "떠난 영혼들이 있는 장소, 그 이름,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통의 종류"는 "성경에 의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위령 미사는 연옥에 있는 떠난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허용되었다.[1]
이 조항들은 또한 성 금요일에 십자가에 입 맞추는 것과 같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반대하는 많은 가톨릭 의식과 관행의 사용을 옹호하는 한편, 대중적인 남용과 과도함을 가볍게 비판했다. 종교적 이미지의 사용은 허용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 앞에서 무릎을 꿇거나 그것들에게 서원을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다.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다른 모든 성인에게 드리는 기도는 미신을 피하는 한 허용되었다.[1]
10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성경과 세 가지 보편적 신조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요약이다.
# 세례는 용서와 재생을 부여하며, 유아의 경우에도 구원에 필요하다. 이는 재세례파와 펠라기우스주의의 견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 고백과 사면을 포함한 고해 성사는 구원에 필요하다.
#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례에 실재 임재한다.
# 칭의는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선행은 필요하다.
# 이미지는 미덕과 좋은 예의 표현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 성인들은 삶의 모범으로서, 그리고 신자들의 기도를 돕는 자들로서 존경받아야 한다.
#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허용되며, 성일은 지켜져야 한다.
# 성직자 의복, 성수 뿌리기, 성촉절에 촛불 들기, 재의 수요일에 재 뿌리기 등 다양한 의식과 예식을 지키는 것은 좋고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고 자선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연옥 교리는 성경적으로 불확실하다. 교황의 면죄부나 특정 장소(예: ''scala coeli'' 미사)에서 드리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즉시 연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은 연옥과 관련된 남용은 거부되어야 한다.
3. 2. 주교의 책 (1537)
토머스 크롬웰은 1537년 2월, 추가적인 신학적 논의를 위해 주교 및 고위 성직자들의 전국 종교 회의를 소집했다.[2] 여기서 ''그리스도교인의 서''(The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Man)(통칭 ''주교의 책''으로 불림)가 출판되었는데, 여기서 "institution"(서)이라는 단어는 "instruction"(지침)과 같은 의미였다.[2] ''주교의 책''은 십조항의 준(準) 루터주의를 보존했고, 칭의, 연옥, 세례, 성찬, 참회에 대한 조항은 변경 없이 새로운 책에 통합되었다.[2]종교 회의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7성사(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종부성사) 중 4개가 십조항에서 제외된 것에 분노했다. 존 스토크슬리는 7성사 모두를 주장했지만, 토머스 크랜머는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했다. 결국, 빠졌던 성사들은 복원되었지만 "존엄성과 필요성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섹션에 배치되었다. 세례, 성찬, 참회만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확실한 도구 또는 치료제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되었다.[2] 견진성사는 초대 교회가 사도들의 안수에 대한 기록을 모방하여 도입했다고 선언되었다.
''주교의 책''에는 신조, 십계명, 주기도문, 성모송에 대한 해설이 포함되었다.[2] 이는 1535년 윌리엄 마셜의 기도서(영어로 된 시간의 서)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다시 루터의 저작에 영향을 받았다. 마셜의 뒤를 이어, ''주교의 책''은 전통적인 가톨릭의 십계명 순서를 거부했는데, 여기서 새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의 일부였다. 동방 정교회와 울리히 츠빙글리의 취리히 교회의 합의에 따라, ''주교의 책'' 저자들은 이 계명들을 분리하는 유대교 전통을 채택했다.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형상을 허용하면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해설은 성부 하느님의 형상에 반대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형상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으로 죽은 형상을 호화롭고 영광스럽게 장식하는 데 더 열심인 자들"을 비판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상 파괴주의를 장려했고, 이는 영국 종교 개혁의 특징이 되었다.
''주교의 책''에 참여한 46명의 신학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성경을 번역하고 ''공동 기도서''를 편찬하는 데 참여했다.
1537년 8월, 이 책은 국왕에게 제출되었고, 국왕은 매주 일요일과 축제일에 설교단에서 이 책의 일부를 낭독하도록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고, 스스로 개정된 ''주교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는 제안된 여러 변경 사항 중 하나로,[3] 원래의 신앙에 의한 칭의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켰다. 이 개정판은 출판되지 않았다. ''주교의 책''은 국왕이나 종교 회의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조항이 잉글랜드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적 기준이 되었다.
3. 3. 6개 조항 (1539)
헨리 8세는 외교적 고립과 가톨릭 동맹을 우려하여 슈말칼덴 동맹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1539년 5월, 새로운 의회가 소집되었고, 재상 오들리는 귀족원에 국왕이 종교적 통일을 원한다고 말했다. 교리 검토 및 결정을 위해 보수적인 주교 4명과 개혁적인 주교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명되었다.[5] 5월 16일, 노포크 공작은 위원회가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으며, 귀족원이 여섯 가지 논쟁적인 교리적 질문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5]
- 성찬이 화체설 없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두 가지 형태로의 성찬이 평신도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여부
- 수도 서원의 정절 서약이 신성한 율법의 일부로서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 성직자 독신이 의무화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적인(서원) 미사가 신성한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지(정당한지) 여부
- 고해성사(사제에게 하는 고백)가 신성한 율법의 일부로서 필요한지 여부
이후 몇 달 동안, 국왕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의회와 소집에서 이 질문들이 논의되었다. 최종 결과는 여섯 번째 질문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가르침을 긍정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형태로의 성찬, 강제적인 성직자 독신주의, 정절 서약 및 서원 미사는 정당한 형태였다. 개신교도들은 고해성사가 신성한 율법에 의해 요구되지는 않지만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고 필요하다"고 선언되어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실재가 전통적인 용어로 확언되었지만, '화체설'이라는 단어 자체는 최종 버전에 나타나지 않았다.[6]
6개 조항은 1539년 6월에 법률이 되었는데, 십개조와 달리 6개 조항은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6개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이 가해졌다. 화체설을 부인하는 것은 철회할 기회 없이 화형에 처해졌다. 다른 조항들을 부인하는 것은 교수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받았다.
3. 4. 왕의 책 (1543)
1540년 4월 헨리 8세가 좋아하지 않았던 ''주교의 책''을 수정하기 위해 의회가 다시 소집되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전통주의자와 개혁가 모두 포함되었지만, 전통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했다.[7] 1543년 4월, 공의회는 수정된 텍스트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텍스트의 정식 명칭은 ''국왕의 책''(The Necessary Doctrine and Erudition for Any Christian Man)이다.[7] ''국왕의 책''은 1537년 판보다 더 전통적이었으며, 국왕 자신의 많은 수정을 포함했다. 5월 6일 특별 귀족 회의에서 승인되었으며, 국왕의 권위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주교의 책''과 달랐다. 또한''국왕의 책''에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가 완전히 거부되었다. 토마스 크랜머는 참된 믿음에는 선행이 따른다는 점(믿음이 ''혼자''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을 주장하며 이 교리를 지키려 했지만,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헨리 8세는 설득되지 않았고, 텍스트는 믿음이 "오직 혼자서도, 혼자서만도"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수정되었다. 또한 각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얻는 데 있어서 ... 일꾼"이 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왕의 책''은 미사, 화체설, 고해, 교회 의식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했으며, 전통적인 7성사는 그 중요성에 대한 구별 없이 모두 포함되었다.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형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 "경건한 존경"을 드리는 것만을 금지한다고 가르쳤다. 그리스도와 성인의 형상을 보는 것은 "주님께 감사 드리도록 자극하고, 불을 지피고, 감동"을 주었다.
''국왕의 책''이 전통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한 가지 영역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연옥에 관한 것이었다. ''국왕의 책''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나 미사가 개인의 영혼에게 유익한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가르쳤으며,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이름은 삼가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논쟁하거나 추론하지 말라"고 권고받았다. 연옥에 대한 적대감은 교황의 권위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왕의 행동 자체는 모순된 신호를 보냈다. 1540년, 헨리 8세는 죽은
3. 5. 42개 조항 (1553)
에드워드 6세 즉위 후, 캔터베리 대주교 토머스 크랜머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권력을 잡았다. 크랜머는 독일과 스위스 개혁가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주의적 공통 신조를 만들고자 했으나, 잉글랜드 국교회의 교리적 입장을 명확히 하는 42개 조항 작성이 우선되었다.[8] 1549년 시작된 42개 조항 작성은 1552년 11월에 완료되었고, 1553년 6월 에드워드 6세의 승인을 받은 왕명으로 공표되었다.[8] 모든 성직자, 교사, 대학교 구성원들은 이 조항에 서명해야 했다.42개 조항은 "절제된" 칼뱅주의 신학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8] 루터교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견해도 있다.[8]
1553년 에드워드 6세가 사망하고 메리 1세가 즉위하면서 42개 조항은 폐지되었고, 크랜머 등은 처형되었다.
4. 39개조 신조의 발전과 내용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면서 매튜 파커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고, 1563년 파커 대주교의 주도로 소집된 주교회의는 42개 조항을 개정하여 39개 조항을 만들었다.[1]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가톨릭 성향 신하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제29조를 삭제, 38개 조항으로 줄였다.[2]
1571년, 에드먼드 게스트 주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9조가 다시 삽입되어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는다고 선언했다.[3] 이는 1570년 교황 비오 5세가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더 이상 가톨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4] 결국 39개 조항이 여왕의 승인을 받았고, 주교와 성직자들은 이에 동의해야 했다.[5]
39개조 신조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교리적 입장을 가톨릭, 칼뱅주의, 재세례파와 관련하여 설명한다.[1]
39개조는 내용에 따라 여덟 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2]
'''조항 1-5: 하나님의 교리'''
처음 다섯 개의 조항은 하나님, 성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명시한다. 이는 헬베티아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16세기와 17세기의 다른 교리적 진술과는 다른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계시와 성경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3]
'''조항 6-8: 성경과 신조'''
이 조항들은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므로,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교리도 믿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은 성경적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한다. 외경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도덕적 지침과 거룩한 삶의 모범을 위해 계속 읽혀지고 있다.[4]
'''조항 9-18: 죄와 구원'''
이 조항들은 원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논한다(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다). 중세 가톨릭의 과잉 공로에 대한 가르침과 선행을 행하는 것이 칭의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일치하는 공로). 또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급진적인 개신교의 가르침도 거부한다.[5] "생명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예정의 교리를 다루며, 이중 예정(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기하도록 예정하셨다는 믿음)은 지지하지 않고,[6] 배교가 확인된다.[7]
'''조항 19-21: 교회와 그 권위'''
보이는 교회의 본질과 권위를 설명한다. 교회는 성경에 따라 신앙과 질서의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며, 교회의 공의회는 시민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소집될 수 있다. 교회 공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행위가 성경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따라야 한다.[8]
'''조항 22-24: 교회에서 피해야 할 오류'''
연옥, 면죄부, 종교적 이미지의 사용, 성도들의 호칭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을 정죄한다. 전례 언어로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가톨릭 관행은 자국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교회 권위에 의해 소환되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설교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9] 이는 기독교인이 교회 권위에 반하여 자신의 주도로 설교하고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개신교의 믿음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10]
'''조항 25-31: 성례전'''
잉글랜드 성공회의 성례 신학을 설명한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며,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을 창조하고 강화하신다. 성례전이 단지 사람의 믿음의 외적 표징일 뿐이라는 급진적인 개신교의 믿음은 부인된다.[11] 7성례를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와 달리, 세례와 성찬례 단 두 가지만 인정한다.[12] 가톨릭이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 의식은 사도들의 타락한 모방(견진성사, 참회, 종부성사)이거나 "성경에 허용된 삶의 상태"(서품과 결혼)로 식별된다.[12]
갱생 (또는 새 생명의 선물), 교회 구성원,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양은 모두 세례를 통해 받는다.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정과 가장 일치하며"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주의 만찬에서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적 유익을 받는다. 화체설에 대한 가톨릭 교리는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반하는 것"으로 정죄되며, 빵과 포도주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참여자들은 성령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리신 제물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 속죄, 그리고 만족이다"라고 선언하며, 이는 미사가 살아있는 자와 연옥에 있는 죽은 자의 죄의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생각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제한 속죄가 확인된다.
'''조항 32-36: 교회의 훈련'''
성직자의 결혼 관행과 교회의 파문 권한을 옹호한다. 교회 안의 전통과 의식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며, 국가 교회는 인간의 권위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설교집 제1, 2권''은 정확한 교리를 담고 있으며 교회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하며, 1549년과 1552년 기도서에 포함된 서임 예식을 옹호한다.
'''조항 37-39: 기독교인과 시민 사회'''
군주의 역할을 잉글랜드 성공회의 수장으로 확인하고, 교황의 관할권에 대한 모든 주장을 거부한다. 국가가 사형을 사용할 권리를 옹호하고, 기독교인은 군대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기독교인의 재산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재세례파의 가르침을 거부하지만,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민적 목적을 위한 맹세의 도덕성을 옹호한다.
4. 1. 발전
에드워드 6세가 1553년에 사망하고, 가톨릭 신자인 메리 1세(잉글랜드 여왕)가 즉위하면서 잉글랜드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다시 결합되었고, 42개 조항은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메리 1세가 사망한 후,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면서 매튜 파커가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1563년, 파커 대주교의 주도로 소집된 주교회의는 42개 조항을 개정하여 39개 조항으로 만들었다.[1] 엘리자베스 1세는 가톨릭 성향 신하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제29조를 삭제, 38개 조항으로 줄였다.[2]1571년, 에드먼드 게스트 주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9조가 다시 삽입되어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 않는다고 선언했다.[3] 이는 1570년 교황 비오 5세가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한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더 이상 가톨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4] 결국 39개 조항이 여왕의 승인을 받았고, 주교와 성직자들은 이에 동의해야 했다.[5]
4. 2. 내용
39개조 신조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교리적 입장을 가톨릭, 칼뱅주의, 재세례파와 관련하여 설명한다.[1]
39개조는 내용에 따라 여덟 개의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2]
'''조항 1-5: 하나님의 교리'''
처음 다섯 개의 조항은 하나님, 성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명시한다. 이는 헬베티아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16세기와 17세기의 다른 교리적 진술과는 다른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계시와 성경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3]
'''조항 6-8: 성경과 신조'''
이 조항들은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므로,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교리도 믿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명시한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은 성경적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한다. 외경은 성경의 일부가 아니지만, 교회에서는 도덕적 지침과 거룩한 삶의 모범을 위해 계속 읽혀지고 있다.[4]
'''조항 9-18: 죄와 구원'''
이 조항들은 원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논한다(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는 선물이다). 중세 가톨릭의 과잉 공로에 대한 가르침과 선행을 행하는 것이 칭의를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한다(일치하는 공로). 또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급진적인 개신교의 가르침도 거부한다.[5] "생명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는 예정의 교리를 다루며, 이중 예정(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기하도록 예정하셨다는 믿음)은 지지하지 않고,[6] 배교가 확인된다.[7]
'''조항 19-21: 교회와 그 권위'''
보이는 교회의 본질과 권위를 설명한다. 교회는 성경에 따라 신앙과 질서의 문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며, 교회의 공의회는 시민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소집될 수 있다. 교회 공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그들의 행위가 성경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따라야 한다.[8]
'''조항 22-24: 교회에서 피해야 할 오류'''
연옥, 면죄부, 종교적 이미지의 사용, 성도들의 호칭에 대한 가톨릭 가르침을 정죄한다. 전례 언어로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가톨릭 관행은 자국어로 대체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교회 권위에 의해 소환되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설교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9] 이는 기독교인이 교회 권위에 반하여 자신의 주도로 설교하고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급진적인 개신교의 믿음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10]
'''조항 25-31: 성례전'''
잉글랜드 성공회의 성례 신학을 설명한다.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며,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은 신자들의 믿음을 창조하고 강화하신다. 성례전이 단지 사람의 믿음의 외적 표징일 뿐이라는 급진적인 개신교의 믿음은 부인된다.[11] 7성례를 주장하는 가톨릭 교회와 달리, 세례와 성찬례 단 두 가지만 인정한다.[12] 가톨릭이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다섯 가지 의식은 사도들의 타락한 모방(견진성사, 참회, 종부성사)이거나 "성경에 허용된 삶의 상태"(서품과 결혼)로 식별된다.[12]
갱생 (또는 새 생명의 선물), 교회 구성원,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양은 모두 세례를 통해 받는다. 유아 세례는 "그리스도의 제정과 가장 일치하며"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 주의 만찬에서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적 유익을 받는다. 화체설에 대한 가톨릭 교리는 "성경의 명백한 말씀에 반하는 것"으로 정죄되며, 빵과 포도주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참여자들은 성령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리신 제물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구속, 속죄, 그리고 만족이다"라고 선언하며, 이는 미사가 살아있는 자와 연옥에 있는 죽은 자의 죄의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생각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제한 속죄가 확인된다.
'''조항 32-36: 교회의 훈련'''
성직자의 결혼 관행과 교회의 파문 권한을 옹호한다. 교회 안의 전통과 의식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며, 국가 교회는 인간의 권위에 의해 만들어진 전통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설교집 제1, 2권''은 정확한 교리를 담고 있으며 교회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하며, 1549년과 1552년 기도서에 포함된 서임 예식을 옹호한다.
'''조항 37-39: 기독교인과 시민 사회'''
군주의 역할을 잉글랜드 성공회의 수장으로 확인하고, 교황의 관할권에 대한 모든 주장을 거부한다. 국가가 사형을 사용할 권리를 옹호하고, 기독교인은 군대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기독교인의 재산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재세례파의 가르침을 거부하지만, 기독교인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시민적 목적을 위한 맹세의 도덕성을 옹호한다.
5. 39개조 신조 이후의 역사와 해석
1662년 공동 기도서와 함께 인쇄된 이후, 39개조 신조는 성공회 신앙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9] 1672년 심사법은 1828년에 폐지될 때까지 잉글랜드에서 공직을 맡기 위한 조건으로 이 신조를 준수하도록 했다.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은 1854년 옥스퍼드 대학교 법이 통과될 때까지 여전히 이 신조에 서명해야 했다.
찰스 1세는 1628년 왕실 선언문을 통해 조항의 문자적 해석을 요구하며,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했다.[11] 선언문은 "이후 어떤 사람도 조항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인쇄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되며, 조항의 명확하고 완전한 의미에 복종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항의 의미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1]
그러나 조항의 의미는 이전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복음주의는 조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해 왔다.
19세기 옥스퍼드 운동 당시, 존 헨리 뉴먼은 트랙 90에서 39개조 신조를 앵글로-가톨릭적으로 해석하려 시도했다.
6. 한국 성공회와 39개조 신조
대한성공회는 39개조 신조를 역사적인 신앙 고백으로 존중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분단, 민주화 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39개조 신조를 이해하고 실천한다. 한국의 전통 종교 및 문화와의 관계, 사회 정의 실현, 평화 통일 운동 등에 대한 관심은 대한성공회의 39개조 신조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7. 비판
종교 개혁 시기에 제정된 39개조 신조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여성 안수, 동성애 등의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사회 불평등 심화, 환경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참조
[1]
웹사이트
Ten Articles 1536
http://www.reformati[...]
2018-08-03
[2]
간행물
The Institution of A Christen Man
https://archive.org/[...]
Thomas Berthelet
1537
[3]
서적
2017
[4]
서적
1996
[5]
서적
2017
[6]
웹사이트
The Act of the Six Articles
http://www.tudorplac[...]
1539
[7]
간행물
The Necessary Doctrine and Erudition for Any Christen Man
https://archive.org/[...]
Thomas Barthelet, King's Printer
1543
[8]
서적
Thomas Cranmer: Churchman and Scholar
The Boydell Press
1993
[9]
웹사이트
Institution of an Incumbent
http://www.ireland.a[...]
Church of Ireland
[10]
웹사이트
Thirty-Nine Articles, or Articles of Religion
https://www.episcopa[...]
2023-04-25
[11]
웹사이트
The King's Declaration Prefixed to the Articles of Religion (Nov. 1628)
https://history.hano[...]
2022-11-02
[12]
웹사이트
英国聖公会の39箇条(聖公会大綱)
http://www.f-frank.s[...]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