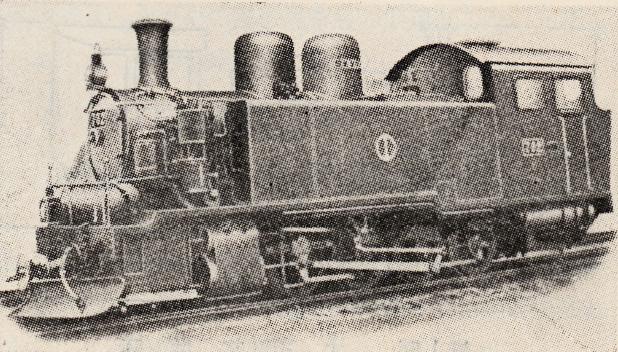조선철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조선철도는 1923년 9월 1일, 6개의 철도 회사를 합병하여 설립된 한반도 최대의 사기업이었다. 조선중앙철도, 조선삼림철도 등 6개 회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조철'이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일제강점기 동안 철도 건설 및 버스 사업, 황해도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며 주요 간선철도가 국유화되었고, 1946년 미군정의 군정법령에 의해 국유화되었다. 이후 충북선, 경북선, 경동선 등 여러 노선을 운영했으며, 증기 기관차와 디젤 기관차를 사용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철도 기업 - 유로스타
유로스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국제 고속철도 서비스로, 영불 해저터널을 통과하며 다양한 노선과 높은 정시 운행률을 제공하고 서비스 개선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철도 기업 - 트렌이탈리아
트렌이탈리아는 2000년 설립된 이탈리아의 주요 철도 운송 회사로,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속철도 '프레체'를 포함한 다양한 등급의 열차를 운영하여 이탈리아 국내외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해외 철도 운영에도 참여한다. - 일제강점기의 교통 - 황해선
황해선은 1919년 산업 철도로 개통된 협궤 노선에서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확장되었으나, 해방 후 분할되어 현재는 대부분 북한 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 일제강점기의 교통 - 동만주철도
동만주철도는 1930년대 일본 자본으로 건설되어 함경북도 경원역과 훈춘을 연결하는 협궤 철도로 시작했으며, 이후 만주국 영토 내로 연장되었으나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폐선되었다. - 없어진 기업 - 뉴스 코퍼레이션
1979년 루퍼트 머독이 설립한 뉴스 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신문과 방송 채널을 인수하며 성장했으나, 논란과 분할을 거쳐 현재는 출판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보수적 편향성으로 비판받고 있다. - 없어진 기업 - 조선식산은행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제 수탈에 관여하며 조선산미증식계획 지원, 전쟁 물자 생산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다 광복 후 한국식산은행으로 개칭,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 업무 이관 후 해산되었다.
2. 역사
1923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조선중앙철도, 남조선철도, 서선식산철도, 조선삼림철도, 조선산업철도, 양강척림철도 등 6개 사철 회사가 합병하여 자본금 54.5억엔으로 조선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1] 사장에는 "제지왕"으로 불린 오오카와 헤이사부로가 취임했지만,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중역들이 계속 파견되는 등 총독부와 유착이 강한 회사였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큰 사설철도 회사였으며, 조선총독부 철도가 "선철"로 불린 것과 달리 조선철도는 '''조철'''로 불렸다.[2]
조선철도는 1927년 자회사인 북선식산철도를 설립하여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2] 또한, 버스 사업과 황해도 개발에도 투자했다.
임원 선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대 사장은 오오카와 헤이사부로였으나, 1923년 말 노무라 류타로로 교체되었다.[10] 1924년 1월에는 와타나베 카이치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부사장에는 조선총독부 관료 이리사와 시게마로가 임명되는 등 총독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11] 1926년에는 오오카와 헤이사부로가 다시 사장 자리를 되찾았다.[10]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1939년 황해선을 시작으로 1940년 경북선 등 주요 간선 철도가 국유화되었다. 1942년에는 조선경동철도가 조선철도에 합병되면서 경동선을 운영하게 되었다.
1945년 광복 당시 조선철도에는 충북선과 경동선만 남아있었다. 미군정은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면서 조선철도의 대주주가 되었고, 1946년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다.[18] 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 사업은 민간에 불하되었고, 철도 노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하여 현재 한국철도공사 노선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2. 1. 설립 배경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본은 조선의 철도망 구축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본국의 방침에 따라 1914년부터 민간 철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조선 내 자본 부족과 일본 기업들의 투자 기피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부터 보조율을 7푼으로, 1919년 9월부터는 8푼으로 인상했다. 때마침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일본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1919년에만 조선에 사설 철도 회사가 7개나 설립되는 등 일본 기업들의 조선 철도 투자가 활발해졌다.[11]그러나 이들이 면허를 받은 철도를 착공하기도 전에 다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작은 회사들이 난립하면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철도 회사들의 합병을 추진했고, 1923년 6개 회사가 합병하여 조선철도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2. 2. 합병 이전 회사들
1923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조선중앙철도, 남조선철도, 서선식산철도, 조선삼림철도, 조선산업철도, 양강척림철도 등 6개 사철 회사가 합병하여 조선철도가 설립되었다.[1] 이들 회사는 자본금 54500000JPY 규모로 합병되었으며,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사기업이었다.[2]사장 선출은 난항을 겪었다. 처음에는 "제지왕"으로 불린 조선삼림철도 전 사장 오카와 헤이사부로가 임시 사장을 맡았으나, 이후 조선중앙철도 전 사장 노무라 류타로, 호쿠에츠 철도 경영자이자 조선중앙철도 전 이사였던 와타나베 카이치 등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조선총독부는 부사장으로 총독부 관료 이리사와 시게마로를 앉히는 등,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11]
합병된 6개 회사 중 조선중앙철도가 존속 회사가 되었고, 나머지 5개 회사는 해산되어 조선철도에 흡수되었다.
2. 2. 1. 조선중앙철도
1916년 조선경편철도회사로 창립되었으며, 시부사와 에이이치와 관련된 회사였다.[12] 후쿠하라 아리노부, 이시즈카 에이조, 오노 킨로쿠 등이 주요 주주였고,[11] 노무라 류타로가 경영을 맡았다.2. 2. 2. 남조선철도
1920년 스즈키 상점 관련 회사로 설립되었다.[13] 사카이데 나루미(스즈키 상점 간부의 차남, 전 대장성 기술자, 전 조선총독부 토목국 공무과장)가 사장을 맡았다.[13] 가네미츠 노부오, 스즈키 요네, 야마시타 가메사부로 등이 주요 주주였다.[11]2. 2. 3. 서선식산철도
1919년경 미쓰비시 제철이 황해도 은산면철도(광산철도)를 매수하여 설립되었다.[12] 사장은 야마모토 테이지로였다.[11] 주요 주주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대표 이시즈카 에이조), 미쓰비시 제철, 야마모토 테이지로 등이었다.[11]2. 2. 4. 조선삼림철도
1920년에 설립되었다.[12] "제지왕" 오카와 헤이자부로가 목재 반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노선은 미개통 상태였다. 주요 주주는 이시즈카 에이조, 오카와 헤이자부로 등이었다.[11]2. 2. 5. 조선산업철도
1919년경 후지야마 라이타의 다이닛폰 제당 회사의 조선 진출과 관련하여 설립되었으나, 노선은 개통되지 않았다.[12][14] 이시즈카 에이조, 후지야마 라이타 등이 주요 주주였고,[11] 오카무라 사우마츠가 사장을 맡았다.[14]2. 2. 6. 양강척림철도
1920년경 설립되었다.[12] 오지 제지를 필두 주주로 하여 목재 반출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노선은 미개통 상태였다.[11] 주요 주주는 후지와라 긴지로, 후쿠하라 토시마루, 카이시마 타이치, 시마즈 타다마로, 이와하라 겐조 등이며,[11] 사장은 후쿠하라 토시마루였다.[11]2. 3. 사업 전개
1923년 9월 1일, 조선총독부의 요청으로 조선중앙철도, 남조선철도, 서선식산철도, 조선삼림철도, 조선산업철도, 양강척림철도 등 6개 사철 회사가 합병하여 자본금 5,450만엔으로 발족했다.[15] 사장에는 제지왕(製紙王|제지왕일본어)이라 불린 오오카와 헤이사부로(ja)가 취임하는 한편, 조선총독부 철도국으로부터 중역으로 계속 인재가 들어오는 등, 총독부와의 유착이 강한 회사였다. 건설한 노선과 지역적인 확대를 포함, 당시 조선에 있던 최대의 사설철도 회사였다. 조선총독부 철도가 "선철(鮮鐵)"이라 불린데 반해, 조선철도는 '''조철(朝鐵)'''이라 불렸다.합병된 6개 회사는 다음과 같다:[1]
- 조선중앙철도
- 조선삼림철도
- 조선산업철도
- 남조선철도
- 서선식산철도
- 량강척림철도
당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사기업이었으며 자본금은 54.5억엔이었다.[2] 조선총독부 철도를 줄여서 '''선철'''이라고 불렀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조선철도는 '''조철'''로 줄여 불렀다.
임원 선출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에는 제지왕으로 불린 조선삼림철도 전 사장 오오카와 헤이사부로가 사장으로 임시 취임했지만, 1923년 말에는 조선중앙철도 전 사장 노무라 류타로가 사장으로 취임했다.[10] 1924년 1월에는 주주 마에야마 큐키치가 추천한 와타나베 카이치(호쿠에츠 철도 경영자이자 조선중앙철도 전 이사)가 사장으로 취임했다. 부사장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제출된 인사안을 받아들여 총독부 관료 이리사와 시게마로를 앉혔다. 그 외 이사로 타케와 사부로(전 철도 기술자[9]), 조선산업철도 전 사장 오카무라 사우마츠, 남선철도 전 사장 사카데 나루미, 감사역으로 전 부산 영사이자 마에야마와 친분이 있는 무로타 요시후미, 서선식산철도 전 사장 야마모토 테이지로, 총독부가 추천한 동양척식 이사 오자키 케이요시가 취임했다.[11] 1926년에는 오오카와 헤이사부로가 사장을 다시 차지하고, 부사장에는 양강척림철도 전 사장 후쿠하라 토시마루가 취임했다.[10]
조선철도는 버스 사업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황해도 개발에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1927년에는 자회사인 북선식산철도를 설립하여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했다.[2]
2. 4. 태평양 전쟁과 국유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등으로 전시 체제가 강화되자, 조선총독부는 주요 간선 철도를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39년 4월 1일 황해선이, 1940년 3월 1일 경북선이 국유화되었다.[15] 1942년 10월 조선경동철도(朝鮮京東鐵道)가 조선철도에 합병되었다. 조선철도는 조선경동철도가 경영하던 수원 ~ 여주 및 수원 ~ 인천항 간 철도 노선을 경동선으로 명명하였다.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가 항복할 당시, 조선철도가 보유하고 있던 철도 노선은 충북선과 경동선만 남아있었다. 1945년 12월 6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33호를 공포하여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을 몰수했고, 미군정청이 조선철도의 대주주가 되었다. 조선철도는 미군정의 감독 하에 경영을 계속하다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해 국유화되었다.[18] 조선철도가 경영하던 여객 자동차(노선버스), 화물 자동차를 비롯한 부대 사업은 모두 민간에 불하되었으나, 철도 노선은 미군정청(남조선과도정부)가 계속 경영하였고,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인수하였다.
3. 철도 노선
조선철도는 표준궤와 협궤 두 가지 궤간의 철도 노선을 운영하였다.
표준궤 노선 중 충북선, 경북선은 현재 한국철도공사 노선으로 운영 중이며, 전남선, 경남선, 경동선은 각각 광주선, 경전남부선, 동해중부선으로 변경되었다. 영춘선은 영동선의 일부가 되었고, 광려선은 선철 송려선으로 변경되었다.
협궤 노선 중 황해선은 여러 노선으로 분할되었으며, 함북선은 무산선으로, 경동선 협궤 구간은 수려선과 수인선으로 변경되었다. 신흥철도에서 인수한 함남선, 남흥선, 송흥선, 장진선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노선으로 운영 중이다.
3. 1. 표준궤
조선철도는 여러 표준궤 노선을 운영하거나 건설하였다. 주요 노선은 다음과 같다.- 충북선(조치원역-충주역): 현재 한국철도공사 충북선으로 운영 중이다.
- 광려선(광주송정역-여수역): 1936년 선철 송려선으로 변경되었다.[1]
- 경북선(김천역-안동역): 현재 한국철도공사 경북선으로 운영 중이다.
- 경남선(마산역-진주역): 1931년 선철 경전남부선의 일부가 되었다.
- 전남선(광주송정역-담양): 1928년 선철 광주선 (광주송정역-광주역)으로 변경되었다.
- 영춘선(영주역-내성역): 현재 한국철도공사 영동선의 일부이다.
- 경동선 (대구역–울산역, 포항역–학산역): 1928년 국유화되어 남만주철도 동해중부선이 되었다.
3. 1. 1. 충북선
경부본선 조치원역에서 청주와 음성을 거쳐 충주에 이르는 노선으로 조선중앙철도로부터 승계된 노선이다. 승계 당시 조치원역 ~ 청안역(지금의 증평역) 구간이 개통된 상태였으며, 1928년 12월 25일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19] 1937년 7월 19일에 충주에서 영월까지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개통하지는 못했다. 조선철도 설립 당시부터 국유화될 때까지 경영하던 유일한 노선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충북선으로 운영 중이다.3. 1. 2. 전남선
남조선철도로부터 승계된 노선으로, 본래 마산선 마산역에서 진주, 하동, 구례, 곡성, 광주를 거쳐 호남선 송정리역에 이르는 본선과 도중의 원촌[19]에서 분기하여 남원, 임실을 거쳐 전북철도주식회사선[20] 전주역에 이르는 지선으로 되어있던 것을 조선철도에서 송정리 ~ 원촌 ~ 전주 구간을 전남선으로, 마산 ~ 원촌 구간을 경남선으로 분리하였다. 당시 송정리 - 담양 구간이 개통된 상태였으며,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의 경전선 부설 계획에 의해 1928년 1월 1일에 국유화되어 광주선이 되었다.3. 1. 3. 경남선
전남선과 마찬가지로 남조선철도로부터 승계된 노선이다. 승계 당시 전 구간이 미개통 상태였으며, 조선철도에 의해 진주까지 개통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경전선 부설 계획에 의해 1931년 4월 1일에 국유화되어 경전남부선이 되었다.[19]3. 1. 4. 경북선
경부선 김천역에서 경북 북부를 횡단하여 안동에 이르는 노선으로 조선산업철도로부터 승계되었다. 승계 당시 전 구간 미개통이었으나, 1931년 10월 16일에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1940년 3월 1일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국유화되었다.[19] 현재 한국철도공사 경북선으로 운영 중이다.3. 1. 5. 영춘선
영주-내성 노선은 현재 한국철도공사 영동선의 일부이다.3. 1. 6. 광려선
광주-여수 간 노선으로, 1936년 선철 송려선으로 변경되었다.[1]3. 2. 협궤
조선철도의 협궤 노선은 다음과 같다.- '''장진선'''(상통–사수–구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장진선으로 변경되었다.
- '''함남선''' (함흥–함남 신흥, 오로–상통, 풍산–장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신흥선과 장진선으로 변경되었다.
- '''남흥선''' (함흥–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서호선으로 변경되었다.
- '''송흥선''' (함남 신흥–부전호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신흥선으로 변경되었다.
- '''수인선''' (수원-인천): 한국철도공사 수인선으로 변경되었다.
- '''수려선''' (수원–여주): 한국철도공사 수려선으로 변경되었다.
- 함북선(고모산 - 무산, 현재의 함북선과는 별개로, 무산선의 전신)
- 경동선 (대구 - 울산 및 서악 - 포항 - 학산): 표준궤 개궤 후 현재의 대구선, 중앙선 및 동해선의 일부가 되었다.
- 황해선 (표준궤 개궤 후 현재의 황해청년선, 은률선의 일부, 장연선, 옹진선, 백천선, 정동선의 전신)
3. 2. 1. 동해중부선 (일제강점기)
경동선은 경부본선 대구역에서 포항에 이르는 본선과, 도중의 서악역에서 분기하여 경주, 울산을 거쳐 동래에 이르는 구간, 울산에서 분기하여 장생포에 이르는 지선으로 구성된 노선으로, 조선중앙철도로부터 승계되었다. 승계 당시 본선 전 구간 및 서악~울산 간이 개통된 상태였으나,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조선총독부의 동해선 부설 계획에 의해 1928년 7월 1일에 국유화되어 동해중부선이 되었다.[4]3. 2. 2. 황해선
경의선 사리원역을 기점으로 하는 여러 노선으로, 서선식산철도로부터 승계되었다. 황해선은 도중의 상해에서 분기하여 은산면에 이르는 구간, 은산면선 화산역에서 해주에 이르는 구간, 동선 신원역에서 분기하여 하성면에 이르는 구간, 저도선 신천에서 분기하여 해주를 거쳐 해주항에 이르는 구간, 신천 남방의 이목에서 분기하여 장연에 이르는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경의본선 토성역에서 해주에 이르는 구간과 취성에서 옹진에 이르는 구간의 부설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1939년 4월 1일에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국유화되었다.[4]황해선은 표준궤 개궤 후 현재의 황해청년선, 은률선의 일부, 장연선, 옹진선, 백천선, 정동선의 전신이 되었다.[6]
3. 2. 3. 함북선
(고무산 - 무산, 현재의 함북선과는 별개로, 무산선의 전신)3. 2. 4. 경동선
경동선은 경부선 수원역에서 이천을 거쳐 여주에 이르는 구간(수려선)과 수원역에서 인천항에 이르는 구간(수인선)으로 구성된 노선이다. 이 노선은 조선경동철도로부터 승계되었다. 이후 미군정에 의해 국유화되면서 수원 ~ 여주 구간은 수려선, 수원 ~ 인천항 구간은 수인선이 되었다.[4]3. 2. 5. 함남선 (조선철도)
조선철도는 1938년 4월 22일에 자회사인 신흥철도를 흡수하면서,[4] 협궤 노선인 함남선을 인수했다. 함남선은 함흥-함남신흥, 오로-상통, 풍산-장풍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조선철도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노선은 국유화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노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에 편입되었다.[6] 함남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에 의해 신흥선과 장진선으로 변경되었다.3. 2. 6. 남흥선
조선철도가 1938년 4월 22일에 신흥철도를 흡수하면서 인수한 노선 중 하나이다.[4]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으로 넘어가 서호선으로 변경되었다.[6] 함흥–서호 구간이 해당된다.3. 2. 7. 송흥선
조선철도는 1938년 4월 22일에 자회사인 신흥철도를 흡수하면서 협궤 노선인 송흥선을 인수했다.[4] 송흥선 (함남 신흥–부전호반)은 해방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신흥선으로 변경되었다.[6]3. 2. 8. 장진선
조선철도는 1938년 4월 22일 자회사인 신흥철도를 흡수하면서 장진선을 인수했다.[4] 장진선은 상통-사수-구진 구간을 운행했으며, 현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성 장진선으로 변경되었다.4. 운행 서비스
조선철도 노선의 여객 서비스는 광범위했으며, 태평양 전쟁 발발 전에 발행된 마지막 시간표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목록에 포함되었다.[8]
5. 사용 기관차
조선철도는 주로 증기 기관차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기관차를 사용했으며, 대부분 일본의 기샤 세이조에서 제작되었다.[2] 조선철도는 또한 한국에서 디젤 기관차를 사용한 최초의 철도 중 하나였다.[2]
참조
[1]
뉴스
Establishment of the Chosen Railway
http://newslibrary.n[...]
Dong-A Ilbo
1923-09-03
[2]
서적
汽車会社蒸気機関車製造史
Kōyūsha
1972
[3]
간행물
朝鮮總督府官報 (The Public Journal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1930-02-10
[4]
간행물
朝鮮總督府官報 (The Public Journal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1938-05-03
[5]
간행물
朝鮮總督府官報 (The Public Journal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1942-11-04
[6]
서적
将軍様の鉄道 (Shōgun-sama no Tetsudō)
[7]
간행물
朝鮮總督府官報 (The Public Journal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1944-03-29
[8]
간행물
Ministry of Railways Combined Timetable 1 November 1942 (鐵道省編纂時刻表昭和17年11月1日)
Tōa Travel Co. (東亜旅行社)
1942-11-01
[9]
웹사이트
武和三郎
https://kotobank.jp/[...]
[10]
웹사이트
朝鮮鉄道株式会社
https://eiichi.shibu[...]
[11]
논문
植民地期朝鮮への鉄道投資の基本性格に関する一考察―1923年朝鮮鉄道会社の成立を中心に
https://www.jstage.j[...]
[12]
웹사이트
対外事業:朝鮮半島B〔対外事業〕
https://eiichi.shibu[...]
[13]
웹사이트
南朝鮮鉄道
https://www.suzukish[...]
[14]
웹사이트
岡村左右松
https://jahis.law.na[...]
[15]
뉴스
조선철도성립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23-09-03
[16]
문서
조선철도가 정한 노선명칭이며, 합병 이전에는 정식 노선명칭없이 (회사이름)선이라고 불리는게 일반적이었다.
[17]
문서
상해 ~ 은산간 철도는 미쓰비시 제철이 경영하던 것을 1920년 4월에 서선식산철도가 매수한 것이다.
[18]
문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군정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 (1946.05.07) 제2조
"s:군정법령 제75호"
[19]
문서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20]
문서
전북철도주식회사가 경영하던 노선으로 지금의 전라선 익산역 ~ 전주역 구간에 해당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