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스트라우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레오 스트라우스는 독일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1899년 독일에서 태어나 1973년에 사망했다. 그는 고전 철학으로의 회귀를 통해 현대 정치철학을 비판하며, 특히 실증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를 비판했다. 스트라우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사상을 연구하며, 이성과 계시, 그리고 내재적 글쓰기 방식을 강조했다. 그의 사상은 신보수주의를 비롯한 현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으며, 앨런 블룸, 솔 벨로우 등이 그의 제자이다. 하지만 엘리트주의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며, 그의 저작으로는 《자연권과 역사》, 《박해와 저술기법》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허무주의자 -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으로 알려진 19세기 독일 철학자이자, 도덕, 종교, 형이상학 비판, '힘에의 의지', '위버멘쉬', '영원회귀' 등의 개념 제시로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허무주의자 -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는 1889년에 태어나 1976년에 사망한 독일의 철학자이며, 현상학과 실존주의, 언어와 기술 비판을 탐구했고, 대표작으로 『존재와 시간』이 있으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 나치즘 협력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 독일의 정치학자 - 로베르트 미헬스
로베르트 미헬스는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로,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이론을 제시했으며, 정당의 관료화와 소수 엘리트 지배의 관계를 연구했다. - 독일의 정치학자 -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난 정치 철학자로, 전체주의, 악의 평범성, 활동적인 삶 등을 탐구하며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등의 저서를 남겼다. - 독일의 정치철학자 - 알프레트 로젠베르크
알프레트 로젠베르크는 발트 독일인 출신 나치 이론가이자 정치가로,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레벤스라움, 베르사유 조약 폐기 등을 주창하며 나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미쳤고, 나치당 외교정책국장, 동부 점령 지역 장관 등을 역임하며 전쟁 범죄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 독일의 정치철학자 - 한나 아렌트
한나 아렌트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난 정치 철학자로, 전체주의, 악의 평범성, 활동적인 삶 등을 탐구하며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등의 저서를 남겼다.
2. 생애
레오 스트라우스는 독일에서 태어나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고, 종전 후 학업을 이어가 에른스트 카시러의 지도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드문트 후설과 마르틴 하이데거에게서도 철학을 배웠다. 1933년 결혼 후 영국을 거쳐 1936년 미국으로 이주,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 스쿨에서 연구 및 강의를 했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1944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1949년부터 1968년까지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철학 교수로 재직했다. 1973년 폐렴으로 사망했다.[1]
2. 1. 초기 생애 및 교육
레오 스트라우스는 1899년 9월 20일 독일 헤센주 마르부르크 부근의 키르크하인이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다.[1] 1912년 김나지움에 입학하여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와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접했고, 유대인으로서 정치적 시오니즘에 경도된 적이 있었다.[2]1917년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발발로 군에 징집되어 종전 때까지 복무했다. 종전 후 함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 에른스트 카시러의 지도로 〈F. H 야코비의 철학적 독트린의 인식론〉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3][4][5] 프라이부르크와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에드문트 후설과 마르틴 하이데거에게서 철학을 배우기도 했다.
그는 유대인 학생회와 독일 시온주의 운동에 참여하면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레오 뢰벤탈, 한나 아렌트, 발터 벤야민 등 여러 독일 유대 지식인들을 만났다. 벤야민은 평생 스트라우스와 그의 작품을 존경했다. 스트라우스는 야코프 클라인과 가장 친했으며, 게르하르트 크뤼거, 칼 뢰비트, 율리우스 구트만,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프란츠 로젠츠바이크(그에게 첫 번째 책을 헌정), 거솜 숄렘, 알렉산더 알트만, 파울 크라우스 등과 지적으로 교류했다. 칼 슈미트와도 논쟁을 벌였으나, 독일을 떠난 후 슈미트가 답장하지 않아 중단되었다.
2. 2. 유럽에서의 활동과 망명
1933년 파리에서 이혼 경력이 있는 독일계 유대인 마리 베른존과 결혼했다.[1] 1934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여 대영박물관에서 토머스 홉스를 연구했다.[1] 1935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다.[1] 1936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컬럼비아 대학교 사학과에서 연구직을 맡았다.[1] 1938년부터 1948년까지 사회학 연구를 위한 뉴 스쿨(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을 강의했다.[1] 나치의 등장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스트라우스와 달리, 당시 독일에 남아있던 그의 친척들은 집단수용소에서 사망했다.[1] 1944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1]2. 3. 미국으로의 이주와 학문적 활동
1933년 파리에서 이혼 경력이 있는 독일계 유대인 마리 베른존과 결혼한 후, 1934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여 대영박물관에서 토머스 홉스를 연구하였다.[1] 1935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으며, 1936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컬럼비아 대학 사학과에서 연구직을 맡게 되었다.[1] 1938년부터 1948년까지 사회학 연구를 위한 뉴 스쿨(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정치학을 강의했다. 나치의 등장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스트라우스와 달리 당시 독일에 남아있던 그의 친척들은 집단수용소에서 사망했다.[1] 1944년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며, 1949년부터 1968년까지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철학 교수로 재직했다.[1] 시카고 대학교 퇴직 후 1973년 폐렴으로 사망했다.[1]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의 지도를 받아 1921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후에 에드문트 후설(Edmund Husserl)과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게서 철학을 배웠다. 1932년부터 1934년까지 록펠러 장학생으로 파리와 캠브리지에 유학했다. 유대계이자 시오니스트였던 스트라우스는 나치(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의 박해를 피해 1938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원을 거쳐 뉴 스쿨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했으며, 1944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1949년 시카고 대학교에 초빙되어 이후 20년 동안 정치철학 강의와 연구를 수행했다.
3. 사상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을 자신의 영역으로 규정했지만, 철학이 선험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에 이는 동어반복처럼 여겨졌다. 그는 철학이 인간을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본다고 생각했다.
스트라우스는 실증주의처럼 가치와 사실, 과학과 도덕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롭다고 보았다. 그는 사실은 가치와 구별될 수 없으며, 모두 정치적 인간에게서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연을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철학사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꼽았다.[13][14]
스트라우스의 학술적, 철학적 작업은 철학적 연구의 근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고전 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마르틴 하이데거를 염두에 두고, 하이데거와 함께 근대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제1 원리 위에 체계를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은 미숙하며, 인간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우스는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원리, 즉 고전 철학으로의 회귀와 인간 경험에 기초를 둔 철학을 지향했다.
스트라우스 작업의 또 다른 테마는 이성과 계시 사이의 이분법, 그리고 진리를 선언하기 위한 양자 간의 경쟁이다. 그는 종교가 인민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철학과 경쟁적인 원리 체계이며, 따라서 정치라고 보았다. 그는 근대 정치철학이 인간 본성에 대한 환원주의 때문에 종교에 대항하는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대 과학은 인류의 힘을 증가시키고 물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인류의 선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
스트라우스는 인간 본성을 재해석하여 상대주의, 역사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근대 민주주의 등 근대 정치학에 대한 비판에 기여했다. 그는 고전 정치철학이 '인간의 삶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추구했지만, 근대 정치철학은 자족과 안락이라는 필수적인 하부구조 위에 정치적 삶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대 자유주의가 개인적 자유를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우스는 자유가 정치적 삶의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가정은 상대주의적이며, 이는 니힐리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훌륭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스트라우스에게 정치와 철학은 필연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정치철학이 탄생한 순간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정치와 철학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 없고 서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5][16]
스트라우스는 "학자"와 "위대한 사상가"를 구분하며 자신을 학자로 분류했다. 그는 대부분의 철학자가 실제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학자이며, 위대한 사상가만이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큰 문제를 다룬다고 보았다. 학자들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차이점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다룬다.[17]
《자연법과 역사》에서 스트라우스는 막스 베버의 인식론을 비판하고, 마르틴 하이데거의 상대주의를 언급하며,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사상 분석을 통해 자연권의 진화를 논한다. 그는 장 자크 루소와 에드먼드 버크를 비판하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발췌문을 제시한다. 그의 철학은 하이데거 저작에 대한 반응이며, 스트라우스는 현대 정치 이론의 완전한 공식화 이전에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해하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8]
스트라우스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역사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니체를 미화하고 정치화했지만, 니체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원칙들은 이전의 모든 원칙(본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득력이 없고 낯설게 될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 죽음과 같은 진실 대신 생명을 주는 망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19] 하이데거는 니체의 비극적인 허무주의 자체가 서구의 결함 있는 존재 개념에 의해 이끌리는 "신화"라고 믿었다. 알렉산드르 코주브와의 서신에서 스트라우스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역사의 종말이 고전 정치 철학에서 이해하는 철학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을 때 옳았다고 썼다.[20]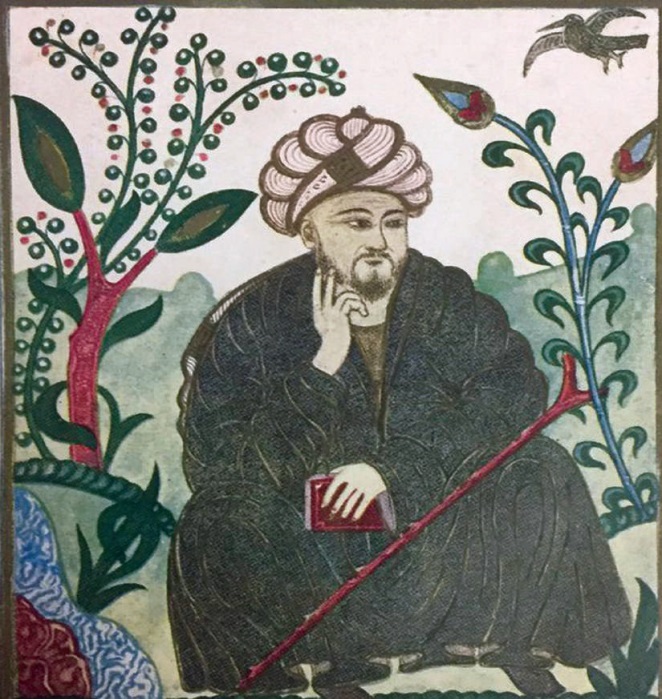
스트라우스는 1930년대 후반 "외재적(또는 공개적) 가르침과 내재적(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구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21] 1952년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에서 그는 진지한 작가들은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내재적으로 글을 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재적 글쓰기가 철학자를 정권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권을 철학의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며, 적절한 독자를 끌어들이고 부적절한 독자를 쫓아내는 등 여러 목적을 수행한다고 보았다.[22][23][24]
스트라우스는 마이모니데스와 알 파라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담긴 글쓰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전 및 중세의 '내재적' 글쓰기 기술이 철학적 학습에 적합한 매체라고 제안했다. 그는 고전 및 중세 철학적 텍스트가 철학자들의 생각을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독자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도록 안내한다고 보았다. 그는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스에 동의하며, 글쓰기가 독자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에서 마이모니데스를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는 암묵적인 불신자"로 제시한다.[25]
스트라우스의 해석학적 주장[26]은 19세기 이전 서구 학자들이 철학적 글쓰기가 아무리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서도 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철학이 관습적인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권위적이고, 현명하며, 자유로운 독자들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옛날 철학자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들의 "글쓰기 기술"은 내재적 의사소통의 기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는 중세 작가들이 대중을 위해 외재적인 의미 하나를, 소수를 위해 내재적인 숨겨진 의미 하나를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사적 전략을 통해 글쓰기의 암묵적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의 주장을 따르면서, 스트라우스는 고대의 대응자들 못지않게 중세의 정치 철학자들이 자신의 글이 이단적이거나 불의하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그 당시의 지배적인 도덕적 관점에 맞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중"(읽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이 도덕의 가장 의로운 수호자로 여기는 "소수"에 의해 박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27]
그의 사상은 현대 미국 정치, 특히 신보수주의(네오콘)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운영의 근거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그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후쿠야마는 부시 행정부 내에 슈트라우스 추종자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슈트라우스가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어리석다고 말했다. 다만,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인물과 슈트라우스 추종자(Straussian)는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고전적인 자연법을 숭배하는 슈트라우스와 인위적인 세계관을 가진 네오콘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자격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앨런 블룸과 솔 벨로우가 있다.
3. 1. 고전 정치 철학의 복원과 현대 비판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을 자신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철학이 선험적으로 정치적이며 고전적인 철학적 이상을 따른다고 믿었다. 스트라우스에게 철학은 인간을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본다.스트라우스는 가치와 사실, 과학과 도덕을 구별하려는 실증주의적 시도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해롭다고 보았다. 그는 사실이 가치와 구별될 수 없으며, 모두 정치적 인간에게서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연을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꼽았다.[13][14]
스트라우스의 학술적, 철학적 작업은 철학적 연구의 근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고전 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마르틴 하이데거와 함께 근대 철학이 인간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을 비판했다. 스트라우스는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원리, 즉 인간 경험에 기초한 철학을 지향했다.
스트라우스는 이성과 비의(秘意, revelation) 사이의 이분법과 경쟁을 중시했다. 그는 종교가 인민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철학과 경쟁적인 원리 체계이며, 따라서 정치라고 보았다. 그는 근대 정치철학이 인간 본성에 대한 환원주의 때문에 종교에 대항하는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대 과학이 인류의 힘을 증가시키고 물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인류의 선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았다.
스트라우스는 인간 본성을 재이해함으로써 상대주의, 역사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기여했다. 그는 고전 정치철학이 "무엇이 인간의 삶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질문을 추구했지만, 근대 정치철학은 자족과 안락이라는 하부구조 위에 정치적 삶을 건설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대 자유주의가 개인적 자유를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우스는 자유가 정치적 삶의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가정은 상대주의적이며, 이는 니힐리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와 훌륭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다.
스트라우스에게 정치와 철학은 필연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정치철학이 탄생한 순간으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정치와 철학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 없고 서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5][16]
스트라우스는 "학자"와 "위대한 사상가"를 구분하여 자신을 학자로 분류했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가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큰 문제를 다루는 반면, 학자들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차이점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만 다룬다고 보았다.[17]
《자연법과 역사》에서 스트라우스는 막스 베버의 인식론을 비판하고, 마르틴 하이데거의 상대주의를 언급하며,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사상 분석을 통해 자연권의 진화를 논의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와 에드먼드 버크를 비판하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발췌문을 제시했다. 그는 하이데거의 저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으며, 현대 정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
스트라우스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역사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보았다. 그는 하이데거가 니체를 미화하고 정치화했지만, 니체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원칙들은 이전의 모든 원칙(본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득력이 없고 낯설게 될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 죽음과 같은 진실 대신 생명을 주는 망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19] 스트라우스는 알렉산드르 코주브와의 서신에서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역사의 종말이 고전 정치 철학에서 이해하는 철학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을 때 옳았다고 썼다.[20]
스트라우스는 1930년대 후반 "외재적(또는 공개적) 가르침과 내재적(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구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21] 그는 1952년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에서 진지한 작가들은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내재적으로 글을 쓴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재적 글쓰기가 철학자를 정권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권을 철학의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며, 적절한 독자를 끌어들이고 부적절한 독자를 쫓아내는 등 여러 목적을 수행한다고 보았다.[22][23][24]
스트라우스는 마이모니데스와 알 파라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플라톤의 『파이데로스』에 담긴 글쓰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전 및 중세의 '내재적' 글쓰기 기술이 철학적 학습에 적합한 매체라고 제안했다. 그는 고전 및 중세 철학적 텍스트가 철학자들의 생각을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독자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도록 안내한다고 보았다. 그는 『파이데로스』의 소크라테스에 동의하며, 글쓰기가 독자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에서 마이모니데스를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는 암묵적인 불신자"로 제시한다.[25]
스트라우스의 해석학적 주장[26]은 19세기 이전 서구 학자들이 철학적 글쓰기가 아무리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서도 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철학이 관습적인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권위적이고, 현명하며, 자유로운 독자들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옛날 철학자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들의 "글쓰기 기술"은 내재적 의사소통의 기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는 중세 작가들이 대중(hoi polloi)을 위해 외재적인 의미 하나를, 소수(hoi oligoi)를 위해 내재적인 숨겨진 의미 하나를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사적 전략을 통해 글쓰기의 암묵적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의 주장을 따르면서, 스트라우스는 고대의 대응자들 못지않게 중세의 정치 철학자들이 자신의 글이 이단적이거나 불의하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그 당시의 지배적인 도덕적 관점에 맞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대중"(읽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이 도덕의 가장 의로운 수호자로 여기는 "소수"에 의해 박해/배척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27]
그의 사상은 현대 미국 정치, 특히 신보수주의(네오콘)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운영의 근거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그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후쿠야마는 부시 행정부 내에 슈트라우스 추종자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슈트라우스가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어리석다고 말했다. 다만,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인물과 슈트라우스 추종자(Straussian)는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고전적인 자연법을 숭배하는 슈트라우스와 인위적인 세계관을 가진 네오콘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자격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앨런 블룸과 솔 벨로우가 있다.
3. 2. 이성과 계시, 철학과 정치
스트라우스는 자신의 영역을 정치철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철학이 선험적으로 정치적이라고 믿으며, 고전적인 철학적 이상을 따랐기에,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동어반복으로 간주된다. 이는 철학이 인간을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이러한 철학의 본성 때문에 스트라우스는 실증주의, 즉 가치와 사실, 과학과 도덕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해롭다고 본다. 그는 사실은 가치와 구별될 수 없으며, 모두 정치적 인간에게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인간 본성(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에 대한 고려 없이 자연을 연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본다.[14]
스트라우스의 학술적-철학적 작업은 고전 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는 철학적 연구의 근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스트라우스는 특히 마르틴 하이데거를 염두에 두고, 하이데거와 함께 근대 철학이 흔들리지 않는 제1 원리 위에 체계를 세우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은 미숙하며, 인간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는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원리, 즉 고전 철학으로의 회귀와 인간 경험에 기초를 둔 철학을 지향했다. 반면 하이데거는 이성적 기획은 숙명이며 이것의 부패는 이 세계로의 새로운 신의 출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라우스 작업의 두 번째 테마는 이성과 계시 사이의 이분법과 양자 사이의 참을 선언하기 위한 경쟁이다. 스트라우스는 종교는 인민의 삶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철학과 경쟁적인 원리 체계이며, 따라서 정치라고 말한다. 고전 정치철학의 연구를 되살리기 위한 그의 작업은 종교와 철학 사이의 논쟁과 연관되어 있다. 그는 근대 정치철학과 이것의 인간 본성에 대한 환원주의는 종교에 대항하는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근대 과학은 인류의 힘을 증가시키고 물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었지만, 인류의 선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었다. 따라서 고전 정치철학으로의 회귀가 요구된다고 스트라우스는 주장한다.
스트라우스는 인간 본성을 재이해함으로써 근대 정치학, 특히 상대주의, 역사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 기여했다.
고전 정치철학은 '무엇이 인간의 삶을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추구했다고 스트라우스는 말한다. 그러나 근대 정치철학은 자족과 안락이라는 필수적인 하부구조 위에 정치적 삶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한다. 근대 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가장 높은 목표로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스트라우스는 자유가 정치적 삶의 가장 높은 지점이라는 가정은 상대주의적 가정, 즉 인간의 훌륭한 삶은 모든 종류의 삶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이며, 이는 니힐리즘으로 인간을 이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자유와 훌륭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무엇이 도시와 인간에게 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한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30]
스트라우스에게 정치와 철학은 필연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정치철학이 탄생한 순간으로 여겼다. 스트라우스는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소크라테스가 인간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연을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꼽았는데,[13]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치적 동물"의 본성 때문이다.[14] 그러나 그는 또한 정치와 철학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 없고 서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5][16]
스트라우스는 "학자"와 "위대한 사상가"를 구분하여 자신을 학자로 분류했다. 그는 철학자 대부분이 실제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학자라고 썼다. 반면 위대한 사상가는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큰 문제들을 다룬다. 학자들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차이점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만 다룬다.[17]
《자연법과 역사》에서 스트라우스는 막스 베버의 인식론 비판으로 시작하여 마르틴 하이데거(이름은 언급되지 않음)의 상대주의에 간략히 언급하고,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의 사상 분석을 통해 자연권의 진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다. 그는 장 자크 루소와 에드먼드 버크를 비판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이 책의 핵심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키케로의 발췌문이 있다. 그의 철학의 상당 부분은 하이데거의 저작에 대한 반응이다. 스트라우스는 현대 정치 이론의 완전한 공식화 이전에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해하고 맞서야 하며, 이는 정치 사상이 존재론과 형이상학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다뤄야 함을 의미한다고 썼다.[18]
스트라우스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헤겔의 역사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에 기반한 사상인 역사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썼다. 스트라우스의 견해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니체를 미화하고 정치화했지만, 니체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원칙들은 이전의 모든 원칙(본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득력이 없고 낯설게 될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 죽음과 같은 진실 대신 생명을 주는 망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19] 하이데거는 니체의 비극적인 허무주의 자체가 하이데거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한 서구의 결함 있는 존재 개념에 의해 이끌리는 "신화"라고 믿었다. 알렉산드르 코주브와의 공개 서신에서 스트라우스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역사의 종말이 고전 정치 철학에서 이해하는 철학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을 때 옳았다고 썼다.[20]
1930년대 후반, 스트라우스는 "외재적(또는 공개적) 가르침과 내재적(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구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21] 1952년 그는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Persecution and the Art of Writing)을 출판하여 진지한 작가들은 내재적으로, 즉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종종 풍자나 역설, 모호한 언급, 의도적인 자기 모순 속에 위장하여 글을 쓴다고 주장했다. 내재적 글쓰기는 철학자를 정권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권을 철학의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여러 목적을 수행한다. 또한 적절한 독자를 끌어들이고 부적절한 독자를 쫓아내며, 내면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철학적 추론의 연습이다.[22][23][24]
마이모니데스와 알 파라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플라톤의 『파이데로스』(Phaedrus)에 담긴 글쓰기에 대한 논의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스트라우스는 고전 및 중세의 '내재적' 글쓰기 기술이 철학적 학습에 적합한 매체라고 제안했다. 고전 및 중세 철학적 텍스트는 철학자들의 생각을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독자들이 전달된 지식과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스트라우스는 『파이데로스』의 소크라테스에 동의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반응하지 않는 글쓰기는 독자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이 질문들은 독자를 저자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한 문제에 대한 이해로 이끈다. 따라서 스트라우스는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에서 마이모니데스를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는 암묵적인 불신자"로 제시한다.[25]
스트라우스의 해석학적 주장[26](특히 1964년 『도시와 인간』(The City and Man)에서 재구성됨)은 19세기 이전 서구 학자들은 철학적 글쓰기가 아무리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서도 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철학은 그 근본에서 관습적인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권위적이고, 현명하며, 자유로운 독자들에 대해 특히 경계해야 한다. 확립된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덕의 원리를 조사함에 있어서, 옛날 철학자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들의 "글쓰기 기술"은 내재적 의사소통의 기술이었다. 이것은 특히 이단적인 정치 사상가들이 종교 재판이나 비슷한 엄격한 재판의 위협 아래 글을 썼던 중세 시대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스트라우스의 주장은 그가 연구하는 중세 작가들이 대중(hoi polloi)을 위해 외재적인 의미 하나를, 소수(hoi oligoi)를 위해 내재적인 숨겨진 의미 하나를 따로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순과 과장법을 포함한 수사적 전략을 통해 이 작가들이 글쓰기의 암묵적인 핵심, 즉 텍스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 또는 역사적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따르면서, 스트라우스는 고대의 대응자들 못지않게 중세의 정치 철학자들이 자신의 글이 이단적이거나 불의하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그 당시의 지배적인 도덕적 관점에 맞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대중"(읽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이 도덕의 가장 의로운 수호자로 여기는 "소수"에 의해서였다. 바로 이 의로운 인물들이 소수의 대중에 대한 권위가 서 있거나 무너지는 고귀하거나 위대한 거짓말을 폭로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박해/배척하려는 가장 큰 경향을 보일 것이다.[27]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현대 사회과학은 스트라우스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 사실-가치 구분을 전제하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 그는 그 뿌리를 계몽주의 철학에서 막스 베버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스트라우스는 베버를 "진지하고 고귀한 사상가"라고 묘사했다. 베버는 가치를 과학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했지만,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그는 니체의 상대주의의 깊은 영향을 받은 파생적인 사상가였다.[28] 스트라우스는 정치를 멀리서 연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스트라우스에게 가치 중립적인 과학적 시각으로 정치를 조사하는 정치학자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었다. 실증주의는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려는 노력에서 오귀스트 콩트와 막스 베버 모두의 계승자였지만, 그것은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 실패했다.[29]
3. 3. 자유주의와 허무주의 비판
스트라우스는 근대 자유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침묵한다고 비판한다. 자유가 정치적 삶의 최고 가치라는 전제는 결국 모든 종류의 삶이 가치 있다는 상대주의적 가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허무주의로 귀결된다고 스트라우스는 주장한다.[13] 그는 자유와 훌륭함이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도시와 인간에게 선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14]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과 철학이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을 정치철학의 탄생점으로 보았으며, 소크라테스가 인간 본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자연을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철학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꼽았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점에 기인한다.[15][16] 그러나 정치와 철학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화해 불가능하며 서로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우스는 "학자"와 "위대한 사상가"를 구분하며 자신을 학자로 분류했다. 그는 대부분의 철학자가 실제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학자이며, 위대한 사상가만이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큰 문제를 다룬다고 보았다. 학자들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차이점에 대한 추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다룬다.[17]
《자연법과 역사》에서 스트라우스는 막스 베버의 인식론을 비판하고, 마르틴 하이데거의 상대주의를 언급하며,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사상 분석을 통해 자연권의 진화를 논한다. 그는 장 자크 루소와 에드먼드 버크를 비판하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발췌문을 제시한다. 그의 철학은 하이데거 저작에 대한 반응이며, 스트라우스는 현대 정치 이론의 완전한 공식화 이전에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해하고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8]
스트라우스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역사주의를 제대로 이해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니체를 미화하고 정치화했지만, 니체는 "진보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원칙들은 이전의 모든 원칙(본질)들이 그랬던 것처럼 설득력이 없고 낯설게 될 것"이고 "유일한 해결책은 ... 죽음과 같은 진실 대신 생명을 주는 망상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었다.[19] 하이데거는 니체의 비극적인 허무주의 자체가 서구의 결함 있는 존재 개념에 의해 이끌리는 "신화"라고 믿었다. 알렉산드르 코주브와의 서신에서 스트라우스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 역사의 종말이 고전 정치 철학에서 이해하는 철학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가정했을 때 옳았다고 썼다.[20]
스트라우스는 칼 슈미트, 알렉상드르 코주브와 중요한 정치철학적 대화를 나누었다. 슈미트는 슈트라우스의 초기 연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는 슈트라우스가 장학금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31] 스트라우스는 '''정치 개념''' 비판을 통해 슈미트가 저서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1932년 편지에서 스트라우스는 슈미트의 정치 신학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지배가 필요하다. ... 모든 인간의 연합은 필연적으로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분리이다… 정치는 국가의 구성 원리가 아니라 국가의 조건이다."라고 요약했다.[32]
스트라우스는 슈미트의 입장에 반대했다. 슈트라우스에게 슈미트와 토마스 홉스로의 복귀는 현대적 자기 이해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슈미트의 입장은 현대 고전적 자유주의적 자기 이해의 증상이었다. 스트라우스는 홉스 시대처럼 이러한 분석이 정치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현대적 방향을 드러내는 "예비 조치"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슈미트의 정치 신학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며, 고대 철학자들의 전통에 따라 인간 본성에 대한 더 넓은 이해와 정치 철학으로의 복귀를 옹호했다.[33]
스트라우스는 코주브와 평생 철학적 우정을 나누었다. 그들은 베를린에서 학생으로 처음 만났고, 서로에게 무한한 철학적 존경심을 가졌다. 코주브는 "슈트라우스와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철학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썼다.[34] 코주브와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적 논쟁은 철학이 정치에서 수행하고 허용되어야 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프랑스 정부 고위 공무원이었던 코주브는 철학자들이 정치적 사건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스트라우스는 철학자들이 철학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도로만 정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35]
3. 4. 해석학적 방법론: 내재적 글쓰기
1930년대 후반, 스트라우스는 "외재적(또는 공개적) 가르침과 내재적(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구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21] 1952년 그는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Persecution and the Art of Writing)을 출판하여, 진지한 작가들은 내재적으로, 즉 다층적 의미를 가지고, 종종 풍자나 역설, 모호한 언급, 의도적인 자기 모순 속에 위장하여 글을 쓴다고 주장했다. 내재적 글쓰기는 철학자를 정권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정권을 철학의 부식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여러 목적을 수행한다. 또한 적절한 독자를 끌어들이고 부적절한 독자를 쫓아내며, 내면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철학적 추론의 연습이다.[22][23][24]마이모니데스와 알 파라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리고 플라톤의 『파이드로스』(Phaedrus)에 담긴 글쓰기에 대한 논의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스트라우스는 고전 및 중세의 '내재적' 글쓰기 기술이 철학적 학습에 적합한 매체라고 제안했다. 고전 및 중세 철학적 텍스트는 철학자들의 생각을 피상적으로 보여주는 대신, 독자들이 전달된 지식과는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따라서 스트라우스는 『파이드로스』의 소크라테스에 동의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반응하지 않는 글쓰기는 독자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이 질문들은 독자를 저자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한 문제에 대한 이해로 이끈다. 따라서 스트라우스는 『박해와 글쓰기의 기술』에서 마이모니데스를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메시지를 숨기는 암묵적인 불신자"로 제시한다.[25]
스트라우스의 해석학적 주장[26](특히 1964년 『도시와 인간』(The City and Man)에서 재구성됨)은 19세기 이전 서구 학자들은 철학적 글쓰기가 아무리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서도 그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철학은 그 근본에서 관습적인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권위적이고, 현명하며, 자유로운 독자들에 대해 특히 경계해야 한다. 확립된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덕의 원리를 조사함에 있어서, 옛날 철학자들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들의 "글쓰기 기술"은 내재적 의사소통의 기술이었다. 이것은 특히 이단적인 정치 사상가들이 종교 재판이나 비슷한 엄격한 재판의 위협 아래 글을 썼던 중세 시대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스트라우스의 주장은 그가 연구하는 중세 작가들이 대중(hoi polloi)을 위해 외재적인 의미 하나를, 소수(hoi oligoi)를 위해 내재적인 숨겨진 의미 하나를 따로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순과 과장법을 포함한 수사적 전략을 통해 이 작가들이 글쓰기의 암묵적인 핵심, 즉 텍스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 또는 역사적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고트홀트 에프라임 레싱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따르면서, 스트라우스는 고대의 대응자들 못지않게 중세의 정치 철학자들이 자신의 글이 이단적이거나 불의하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그 당시의 지배적인 도덕적 관점에 맞춰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대중"(읽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중이 도덕의 가장 의로운 수호자로 여기는 "소수"에 의해서였다. 바로 이 의로운 인물들이 소수의 대중에 대한 권위가 서 있거나 무너지는 고귀하거나 위대한 거짓말을 폭로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박해/배척하려는 가장 큰 경향을 보일 것이다.[27]
"박해와 글쓰기의 예술" 에세이에서 스트라우스는 정보를 "행간에 쓰는" 방식으로 대중으로부터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전제로 보이는데, 스트라우스가 자신의 저술에서 언급하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철학 작품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읽고 쓸 줄 아는 사회 엘리트 계층만 존재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다.[64]
4. 영향 및 유산
슈트라우스는 플라톤의 『국가』가 "정체 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여, 『국가』는 최선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물의 본질, 즉 도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41]
슈트라우스는 말로써 구성된 도시는 "에로스로부터의 추상화에 의해 가능해지기 때문"에 비자연적이라고 주장했다.[42] 그는 "진보"에 회의적이었지만, "복고"—즉 전진 대신 후퇴—를 위한 정치적 의제에도 마찬가지로 회의적이었다.
그는 정치에서 합리주의와 전통주의 사이의 논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2차 세계 대전 이전 독일 우파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세계 국가를 강제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폭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43] 따라서 그는 20세기에 자신이 비난했던 두 가지 전체주의, 즉 파시즘과 공산주의와 거리를 유지했다.
슈트라우스의 저술은 거슈옴 숄렘, 발터 벤야민[49], 한스-게오르크 가다머[59], 알렉상드르 코주브[59]와 같은 다양한 사상가들과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59]에 의해 읽히고 찬사를 받았다. 벤야민은 베를린에서 학생 시절 슈트라우스를 알게 되었고, 평생 동안 슈트라우스에 대한 존경을 표명했다.[3][4][5] 가다머는 슈트라우스의 해석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59]
4. 1. 스트라우스 학파
스트라우스주의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사상과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이 공유하는 연구 방법, 공통 개념, 이론적 전제, 중심 질문, 그리고 교육 방식(교수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60][61] 주로 역사 정치 이론 분야의 대학교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61] 보수적 활동가, 싱크탱크 전문가,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지적 틀로 기능하기도 한다.[61] 하비 맨스필드, 스티븐 B. 스미스, 스티븐 버그는 슈트라우스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일부 슈트라우스 추종자들이 자칭하는 "슈트라우스주의자"들이다. 맨스필드는 "스트라우스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슈트라우스주의자들과 슈트라우스주의자들의 학파는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학파를 "철학 전체에 열려 있는" 것이며, 속하기 위해 믿어야 할 명확한 교리가 없는 것으로 묘사한다.[62]정치 이론 분야에서 이 방법론은 실천가들에게 "정치 사상의 '고전'(Great Books)을 '면밀히 읽는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사상가를 "그 자신이 스스로 이해한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특정 저자의 역사적 맥락이나 역사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무관심하다.[61] 또한 그들이 고전에서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 접근 방식은 문학 연구에서의 기존의 신비평(New Criticism)과 중요한 점에서 유사하다.[61]
고전을 하위 저작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고전은 "그 시대와 장소의 일반적인 사상으로는 결코 환원될 수 없는, 그토록 주권적인 비판적 자기 인식과 지적 능력을 가진" 저자/철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여겨진다.[61] 다른 저작들은 "일류 사상가의 독창적인 통찰에 대한 부수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61]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의 철학이 과거의 것으로 영원히 우리에게서 멀어져 버렸다고 보는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정치 사상의 역사를 읽는 20세기 중반의 역사주의적 전제"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간주된다.[61] 스트라우스주의는 과거의 사상가들이 "진리"를 꿰뚫어보았을 가능성, 그리고 따라서 최근 사상가들이 틀렸을 가능성을 제시한다.[61]
그의 사상은 현대 미국 정치, 특히 신보수주의(네오콘)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운영의 근거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그러한 견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후쿠야마는 저서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슈트라우스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 중 하나로, 이라크 전쟁으로 나아간 부시 행정부 내에 슈트라우스 추종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미국의 종말』35페이지). 다만,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인물(후쿠야마도 그 중 한 명)과 슈트라우스 추종자(Straussian)는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애초에 고전적인 자연법을 숭배하는 슈트라우스와 인위적인 세계관을 가진 네오콘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자격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앨런 블룸과 솔 벨로우가 있다.
4. 2. 대한민국에의 영향
레오 스트라우스의 저술 대부분은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에는 류샤오펑(인민대학)과 간 양 등 저명한 인물을 중심으로 스트라우스 학파가 존재한다. "중국 스트라우스 학파"는 비서구권 맥락에서 서구 정치 이론이 융합된 사례를 보여준다. 최근 한 책의 편집자들은 "중국어권(특히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슈미트와 스트라우스의 수용은 오늘날 슈미트와 스트라우스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논쟁적인 세계에서 서구 근대성의 더 깊은 모순과 비자유주의 사회의 딜레마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썼다.[63]5. 비판
레오 스트라우스는 엘리트주의,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시모어 허쉬(Seymour Hersh) 등 언론인들은 스트라우스가 "결속력 있는 사회를 유지하려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신화"인 고귀한 거짓말(noble lie)을 지지했다고 주장한다.[65][66] 스트라우스는 『도시와 인간(The City and Man)』에서 플라톤의 『국가(Republic)』에 제시된, 모든 정부에 필요한 신화(국가가 불법적으로 취득했을 수도 있는 토지가 국가에 속한다는 믿음, 시민권이 출생의 우연성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믿음)에 대해 논의한다.[67]
샤디아 드루리(Shadia Drury)는 『레오 스트라우스와 미국 우파(Leo Strauss and the American Right)』(1999)에서 스트라우스가 제국주의적 군국주의,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기독교 근본주의(Christian fundamentalism)와 관련된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 드루리는 스트라우스가 "권력자들에 의한 시민들의 영속적인 속임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끌림을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말해줄 강력한 통치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한다. 니콜라스 크세노스(Nicholas Xenos) 역시 스트라우스가 "근본적인 의미에서 반민주주의자이자 진정한 반동(reactionary)이었다"고 주장하며, "피와 뼈, 제국주의적 지배, 권위주의적 통치, 순수한 파시즘(fascism)의 이전의, 자유주의 이전의, 부르주아(bourgeois)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68]
클레스 G. 라인은 스트라우스의 반역사주의적 사고는 도덕적 보편성과 "관습적인 것", "전통적인 것", "역사적인 것" 사이에 인위적인 대조를 만든다고 비판한다. 라인은 스트라우스가 전통 존중이 이성과 보편성을 훼손한다고 잘못 가정하며, 에드먼드 버크에 대한 비판과는 달리 역사적 감각은 보편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 필수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트라우스의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인 자연법 개념은 진정한 보편성을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라인이 "신자코뱅주의"라고 부르는 "신보수주의" 철학은 폴 고트프리트가 쓰기를, 생쥐스트와 레온 트로츠키의 수사법이기도 한데, 철학적으로 빈곤한 미국 우파는 무분별하게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70][71]
피터 미노위츠(Peter Minowitz)는 2009년 저서 『Straussophobia』에서 드루리, 크세노스 등 스트라우스 비판자들을 "편협과 어릿광대짓"으로 비난한다.[72] 스티븐 B. 스미스(Steven B. Smith) 교수는 『Reading Leo Strauss』에서 스트라우스와 신보수주의 사상 간 연관성을 부정하며, 스트라우스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제국주의를 지지한 적이 없고, 정치 철학의 정치적 실천에 대한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올터(Robert Alter)는 서평에서 스미스가 "스트라우스의 정치적 견해와 저술 내용에 대해 설득력 있게 사실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74]
스트라우스의 딸 제니 스트라우스 클레이(Jenny Strauss Clay)는 스트라우스가 "미국 외교 정책을 통제하는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그들의 배후 조종자"라는 비난에 대해 그가 "변화가 반드시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만큼 보수주의자였다"고 옹호한다.
마크 릴라(Mark Lilla)는 신보수주의적 견해에 대한 스트라우스 귀속이 『폭정론』(On Tyranny) 등 스트라우스 저술을 주의 깊게 읽는 것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며, "철학은 정치적 체면과 철학적 삶 모두에 대한 위협으로서 폭정의 위험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철학은 자신의 자율성을 옹호하기 위해 정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만,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요약한다.[76]
네이선 타르코브(Nathan Tarcov) 시카고 대학교 레오 스트라우스 센터(Leo Strauss Center) 소장은 스트라우스의 가르침이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외교 정책(군사적 정복을 통한 자유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등)을 조장했다는 비난에 대해, 스트라우스가 정치 철학자로서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스트라우스는 우리에게 영원한 문제들을 상기시켜 줄 수 있지만, 오늘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해결책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짓는다.[77]
5. 1. 주요 저작
레오 스트라우스의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스피노자의 종교비판》(''Spinoza’s Critique of Religion'', 1965)
- 《박해와 저술기법》(''Persecution and the Art of Writing'', 1952)
- 《자연권과 역사》(''Natural Right and History'', 1953)
- 《마키아벨리》(''Thoughts on Machiavelli'', 1958)
-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What is Political Philosophy?'', 1959)
- 《서양정치 철학사》(''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조셉 크랍시와 공저, 1987)
-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파네스》(''Socrates and Aristophanes'', 1966)
- 《플라톤의 정치철학연구》(''Studies in Platonic Political Philosophy'')
슈트라우스의 저서 및 논문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