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론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철학적 연구로, 지식이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지식의 근원은 무엇인지 등을 탐구한다. 주요 개념으로는 지식, 믿음, 진리, 정당화 등이 있으며, 지식은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숙지에 의한 지식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경험론과 합리론, 기초주의와 정합론,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등의 다양한 학파와 이론이 존재하며, 과학 인식론, 윤리 인식론, 종교 인식론, 사회 인식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사이드바 - 정부수반
한 국가의 행정부를 통솔하는 최고위 공직자인 정부수반은 국가 원수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총리, 수상, 대통령 등으로 불리며 권한과 역할은 헌법에 따라 다르다. - 사이드바 - 공포
공포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강렬한 감정으로, 신체적 반응과 행동 변화를 동반하며, 뇌의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습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치료가 가능하다. - 인식론 - 마음
마음은 의식, 사고, 지각, 감정, 동기, 행동, 기억, 학습 등을 포괄하는 심리적 현상과 능력의 총체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인간 삶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 인식론 - 마르크스-레닌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레닌과 후계자들이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이념으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계급투쟁을 중시하며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평등 사회를 목표로 했으나, 권위주의 통치, 냉전, 소련 붕괴 등으로 영향력이 감소했고 현재 일부 국가에서만 권력을 유지하며 엇갈린 평가를 받는다. - 철학에 관한 - 마르틴 하이데거
마르틴 하이데거는 1889년에 태어나 1976년에 사망한 독일의 철학자이며, 현상학과 실존주의, 언어와 기술 비판을 탐구했고, 대표작으로 『존재와 시간』이 있으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지만, 나치즘 협력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 철학에 관한 -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테네에 아카데메이아를 설립하여 철학, 수학 등을 가르치고 이데아론, 영혼론 등을 주요 사상으로 삼아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2. 인식론의 정의와 주요 개념
인식론(Epistemology)은 지식에 대한 철학적 연구로, '지식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지식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지각, 추론, 증언과 같은 지식의 근원을 조사하여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탐구한다. 또한 지식의 범위와 한계, 즉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도 다룬다.[2] 인식론의 핵심 개념에는 믿음, 진리, 정당화, 증거, 이성 등이 있다.[3]
'인식론'이라는 단어는 지식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ἐπιστήμη'(에피스테메)와 낱말 또는 말하기를 뜻하는 'λόγος'(로고스)를 합쳐 만든 말이다. 스코틀랜드 철학자 제임스 프레더릭 페리어가 존재론(ontology)의 조어 방식을 참조하여 'epistemology'를 만들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270] 독일에서는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와 베르나르트 볼차노가 'Wissenschaftslehre'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에드문트 후설이 이를 다시 채용했다. 프랑스에서는 1908년 에밀 메이에송이 《정체성과 실제》에서 'épistémologie'를 "지식에 대한 이론"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했으며, 과학 철학과 같은 의미로 보았다.[270]
인식론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2. 1. 지식
지식은 일반적으로 정당화된 참된 믿음(Justified True Belief, JTB)으로 정의되지만, 게티어 문제와 같은 반례를 통해 이 정의의 충분조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식의 유형은 크게 명제적 지식(knowledge-that), 절차적 지식(knowledge-how), 숙지된 지식(knowledge by acquaintance) 등으로 구분된다.- 명제적 지식 (Propositional knowledge, 선언적 지식, 알고 있다는 지식, descriptive knowledge):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 "that-절"을 사용하여 선언적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다. 예를 들어, "라비는 캥거루가 깡충깡충 뛴다는 것을 안다"와 같이 표현된다.
- 절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 알고 하는 지식, knowledge-how): 실용적인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이다. 예를 들어, 읽는 방법이나 라자냐를 만드는 방법과 같이 특정 목표와 관련된 지식이다.
- 숙지에 의한 지식 (Knowledge by acquaintance): 경험적 접촉의 결과로 어떤 대상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퍼스시를 알고, 차빠의 맛을 알고, 마르타 비에이라 다 실바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표현에 대하여》(On denoting)와 《철학의 문제들》(Problems of Philosophy)에서 기술된 지식과 숙지된 지식을 구분하였다.[24] 길버트 라일은 《마음의 개념》(The Concept of Mind)에서 선언적 지식(Know that)과 절차적 지식(Know how)를 구분하였다. 마이클 폴라니는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자전거를 타면서 균형을 잡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즉, 자전거 동역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훈련을 거쳐 균형을 잡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는 없다.
에드문트 게티어는 1963년 《정당화된 참된 믿음은 지식인가?》라는 짧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게티어는 어떠한 참된 명제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화된 믿음이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284]
게티어는 두 가지 사고 실험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284]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취직하길 원하는 두 사람, 스미스와 존스가 동전 열 개씩을 가지고 있다. 스미스는 존스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세어 보아 열 개라는 것을 안다. 스미스는 동전을 열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직할 것이라 믿고는 존스가 취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취직하는 사람은 스미스이고 나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개수를 세어 보아 열 개라는 것을 확인한다. 이 상황에서 스미스는 동전 열 개를 가진 사람이 취직한다는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동전의 개수에 대한 지식이 사실이고 둘 중 한 명이 취직한다는 것 역시 사실일지라도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믿음의 정당화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직된다.'는 A에게 '정당화 된 참인 믿음'일지라도, 지식이 될 수 없다. 게티어 문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근거의 검증 없이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티어의 문제 제기 이후 로버트 노직, 사이먼 블랙번과 같은 철학자들은 지식의 조건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게티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285]
일반적으로 지식은 단순한 참인 믿음보다 더 가치있다고 여겨진다. 만일 그렇다면 해석은 무엇인가? 인식론의 가치 문제가 처음 다루어진 것은 플라톤의 《메논》이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메논이 라리사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확히 그곳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 번도 라리사에 가본 적도 없고 라리사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도 그러한 참인 믿음을 지녔다고 지적한다. 소크라테스는 지식과 참된 견해 모두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메논은 왜 지식이 참인 믿음보다 더 가치가 있는지를 물었고, 소크라테스는 지식이 단순한 참인 믿음보다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더 확고하고 정당화된 것, 즉 참인 믿음을 위해 이유를 밝히고 확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한다.[292]
한국 사회에서는 지식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지식인의 역할, 지식 격차 해소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2. 2. 믿음
믿음은 개인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명제적 태도이다. 예를 들어, 눈이 하얗다는 것을 믿는 것은 "눈은 하얗다"라는 명제를 긍정하는 것이다.[65]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기억에 저장되었다가 현실에 대해 생각하거나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 다시 떠올릴 수 있다.[66]신념의 형성에는 종교적 신앙, 타인의 견해에 대한 신뢰, 권위에 대한 인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철학에서는 인식론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며, 어떤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인식의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273][274]
인식론에서 신념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로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있다. 토머스 쿤은 우주에 대한 지식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로 변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276]
한편, 신념은 행동 패턴이나 성향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생수가 있다고 믿는 것은 생수와 냉장고와 관련된 여러 행동 성향, 즉 생수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목이 마를 때 냉장고로 가는 성향 등을 의미한다.[67]
신념은 명제적 지식의 구성 요소, 신념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과 책임, 신념의 정도(신뢰도) 등 다양한 인식론적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69]
명제적 태도로서 신념은 참인 명제나 거짓인 명제를 긍정하는지에 따라 참 또는 거짓으로 나뉜다.[70] 대응 이론에 따르면, 진실은 객관적이며 신념이 사실에 부합하면 참이다.[71] 반면, 일관성 이론은 신념이 일관된 신념 체계에 속하면 참이라고 본다.[72]
2. 3. 진리
철학에서 진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대응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고전적인 전통을 잇는 견해로서, 실재와 관념의 일치를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형이상학』에서 "유를 무, 무를 유라고 논증하는 것이 허위이며, 유를 유, 무를 무라고 논증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였다. 이는 「유·무」라는 「존재론」을 기초로, 이를 「논증한다」는 「판단」이 뒷받침한다.[258] 칸트는 인식과 현상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대응」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응설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진다.[258]
- 명증설: 데카르트가 시작한 견해로, 의식에 명증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진리로 본다. 후설이 이 입장을 계승하였다.
- 정합설 (일관성 이론): 스피노자가 시작한 견해로, 인식이 체계 내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여부로 진리를 판단한다. 중기 플라톤, 라이프니츠에게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258]
- 유용설: 니체, 프래그머티즘에서 주장하는 견해로, 행위의 결과가 유효한지로 진위를 판단한다. 위의 세 가지(명증설, 정합설, 유용설)는 모두 주관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259]
신념은 참인 명제나 거짓인 명제를 긍정하는지에 따라 참 또는 거짓으로 나뉜다.[70] 대응 이론에 따르면, 참은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적인 것이다. 신념은 사실에 부합하면 참이 된다.[71] 일관성 이론은 신념이 일관된 신념 체계에 속하면 참이라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진실은 다른 신념에 따라 상대적이다.[72] 그 외 진리 이론에는 실용주의적, 의미론적, 다원적, 허무주의적 이론 등이 있다.[73] 진실은 인식 과정의 목표이자 명제적 지식의 구성 요소로서 인식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74]
2. 4. 정당화
정당화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75] 이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75] '합리적인', '정당한', '뒷받침되는'과 같은 용어들은 정당화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77] 정당화는 정당화된 믿음과 미신이나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78] 그러나 정당화가 믿음의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력하지만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거짓인 믿음을 형성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79]인식론에서는 정당화를 지식의 한 요소로 보기도 한다. 인식론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명제적 정당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또는 그 이유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는지(신념적 정당화)에도 관심을 갖는다.[8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웃이 위험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미신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명제적 정당화는 있지만 신념적 정당화는 없는 것이다.[82]
신념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내재주의와 외재주의라는 두 가지 주요 견해가 있다.
- 내재주의: 신념의 정당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의 내면에서 작용한다고 본다. 내재주의에는 수용론적 내재주의와 존재론적 내재주의가 있다.
- 수용론적 내재주의: 개인이 ''P''라는 명제를 신뢰하게 되면서 ''P''에 대한 신념이 생기며, 이 신념은 ''P''를 믿을 만한 이유나 근거를 수용함으로써 생긴다고 본다.
- 존재론적 내재주의: 개인의 정신 상태에 의해 신념의 정당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 이 두 관점은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88]
- 내재주의에 대한 논쟁 중 하나로 "새로운 악마 문제"가 있다. 신뢰주의와 같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내재주의적 인식론의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가 말한 사악한 악마와 같은 존재가 있어, 모두가 신뢰하고 경험하는 어떤 주제가 사실은 악마의 조작이라면,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신념은 거짓이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이성적인 방법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신뢰주의에 따르면, 각 개인의 신념에 대한 정당화가 모두 동일한 방식의 합리적 과정을 거쳤더라도, 이 모든 것이 악마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결론처럼 인식은 내면적 사고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89]
- 외재주의: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견해로, "사실"이 신념을 가진 사람과 독립적으로 외부에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수용이나 이성에 대한 선험적인 정신 상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290] 데이비드 멀릿 암스트롱은 지식에 대한 온도계 모델을 제시하면서, 믿음이 지식인지 아닌지는 그 믿음을 구성하는 인지 체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상 작동하는 온도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온도를 가리키면 외부 온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듯이, 우리의 지각 체계가 정상 작동하여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빙성 있게 나타내면 그것이 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인식론이 자연과학과 단절되어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흐른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291]
2. 5. 기타 개념
증거는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인식론에서는 주로 감각적 인상이나 다른 명제와 같은 정신 상태를 증거로 보지만, 법의학 분석가의 혈흔이나 조사 기자의 재정 기록과 같은 물리적 대상도 포함될 수 있다.[95] 증거는 신념이 참일 확률을 높이며,[96] 반박자는 신념에 대한 증거를 약화시키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목격자 증언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알리바이는 반박자가 된다.[97] 증거주의는 정당화된 신념이 적절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98]합리성은 정당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신념'과 '정당화된 신념'은 때때로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합리성은 신념을 다루는 이론적 측면과 결정, 의도, 행위를 다루는 실용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90] 합리성은 좋은 이유에 기반하거나, 일관성을 가지거나,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91] 이론적 합리성의 목표는 정확성과 포괄성으로, 가능한 한 적은 거짓된 신념과 가능한 한 많은 참된 신념을 갖는 것이다.[92]
의심과 확신은 신뢰 수준에 따라 다른 명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이다. 의심은 명제의 타당성이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확신은 그 사람이 명제가 참이라는 데 의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론에서 의심과 확신은 모든 지식의 안전한 토대를 찾으려는 시도와 어떤 신념도 의심에 면역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립하려는 회의론적 프로젝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99]
이해는 주제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포함하는 더 전체적인 개념이다.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그런 방식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암기한 고립된 사실에 대한 지식은 이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00] 지혜는 실용적인 응용을 포함하는 반성적인 이해를 포함하며, 사람들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101]
3. 인식론의 역사
인식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epistemology'는 지식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ἐπιστήμη'(에피스테메)와 낱말 또는 말하기를 뜻하는 'λόγος'(로고스)를 합쳐 만든 말이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제임스 프레더릭 페리에는 존재론('ontology')의 조어 방식을 참조하여 'epistemology'를 만들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270] 독일에서는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와 베르나르트 볼차노가 동일한 의미로 'Wissenschaftslehre'를 사용하였고, 이는 뒤에 에드문트 후설이 다시 채용하였다.[270] 프랑스에서는 1908년 에밀 메이에송이 《정체성과 실제》에서 "지식에 대한 이론"을 뜻하는 용어로 'épistémologie'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학 철학과 같은 의미였다.[270]
서구에서 인식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플라톤은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 문제와 인식 주체로서 영혼을 탐구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등 회의론자들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논하였으며, 이는 피론의 회의주의 학파까지 이어졌다. 고대 로마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 중심의 존재론과 기계론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인간 인식 문제를 해석하려 했다. 중세에도 유럽과 아랍 지역에서 인식론이 발달하였다. 존 로크는 근세 인식론의 화두를 제시하였으며, 근대 인식론은 로크와 르네 데카르트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근대에는 인식의 기원에 관한 이성론과 경험론이 대립했다. 이성론은 주로 유럽에서, 경험론은 영국에서 발달했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 양자를 종합하고자 선험적 관념론을 주장했다. 인식의 본질에 관해서는 관념론과 실재론이 대립했는데, 칸트의 비판주의는 이 양자를 종합하려 했으나 충분하지는 못했다. 그 후 철학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식론도 복잡해졌다. 신칸트주의와 현상학에서는 인식론이 철학의 방법 자체가 되었다.[271]
19세기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은 감각적 인상만으로는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며 경험론에 반대했다.[234] 존 스튜어트 밀은 귀납적 추론을 통해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경험론을 옹호했다.[235] 찰스 퍼스는 모든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항상 자신의 신념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데카르트적 기초주의에 반대했다.[236]
20세기에는 J. L. 오스틴과 칼 포퍼에 의해 오류 가능성이 더욱 탐구되었다.[237] 대륙 철학에서 에드먼드 후설은 판단을 유보하는 회의주의적 관념을 경험 연구에 적용했다.[238] 논리 실증주의는 모든 지식은 경험적이거나 분석적이라고 보았다.[239] 버트런드 러셀은 감각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숙지에 의한 지식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간접적인 기술에 의한 지식을 구분하는 경험론적 감각 자료 이론을 발전시켰다.[240] G. E. 무어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추상적인 철학적 이론에 반대했다.[241] 일상 언어 철학은 일상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에서 인식론적 통찰력을 추출하려 했다.[242]
에드먼드 게티어는 지식이 정당화된 참된 믿음과 같다는 생각에 대한 반례를 고안하여, 많은 철학자들이 대안적인 지식의 정의를 제시하도록 이끌었다.[243] 신뢰주의는 정당화에서 초점을 벗어나 신뢰할 수 있는 근원을 필요하다고 말한다.[244] 덕 인식론은 지적 덕목 또는 인식 능력의 관점에서 신념 형성을 분석한다.[245] 자연화된 인식론은 자연 과학의 개념과 관념을 사용하여 이론을 공식화한다.[246] 20세기 후반 인식론의 다른 발전으로는 사회적, 페미니스트, 역사적 인식론이 있다.[247]
3. 1. 고대 및 중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기원전 427–347년)은 지식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훌륭한 이유에 기반한 것으로서 참된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 조사했다.[204]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은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상기의 한 형태이다.[205]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년)는 과학적 지식에 특히 관심이 많았으며, 감각적 경험의 역할과 일반 원리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을 탐구했다.[206] 기원전 4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헬레니즘 학파 가운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경험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감각은 항상 정확하고 판단의 최고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207] 스토아 학파는 비슷한 입장을 옹호했지만, 명료하고 구체적인 감각에 국한하여 그것을 진실로 간주했다.[208] 회의주의자들은 지식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판단의 유보를 통해 평온의 상태에 도달할 것을 권고했다.[209]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700년에서 300년 사이에 고대 인도에서 편찬된 철학적 경전으로, 자기 성찰, 비교 및 연역의 역할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을 조사했다.[211] 기원전 6세기에 아즈냐나 학파는 지식의 가능성과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급진적인 회의주의를 발전시켰다.[212] 기원전 2세기에 등장한 나야야 학파는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제공하고, 타당한 근원과 타당하지 않은 근원을 구분했다.[213] 이후 불교 철학자들이 인식론에 관심을 갖게 되자, 그들은 나야야와 다른 전통에서 발전된 개념에 의존했다.[214] 불교 철학자 달마키르티(서기 6세기 또는 7세기)[215]는 아는 과정을 일련의 인과적으로 관련된 사건으로 분석했다.[210]
고대 중국 철학자들은 지식을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참여와 근본적으로 연결된 상호 연결된 현상으로 이해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지식을 얻는 목표로 보았다.[216] 묵자(기원전 470–391년)는 역사 기록, 감각적 증거 및 실용적인 결과를 사용하여 신념을 검증하는 실용적인 지식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217] 맹자는 유추 추론을 또 다른 지식의 근원으로 탐구했다.[218] 순자는 경험적 관찰과 합리적 탐구를 결합하려고 했다. 그는 감정과 감정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고 명확성과 추론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19]
이성과 신앙의 관계는 중세의 중심 주제였다.[220] 아랍-페르시아 철학에서 알 파라비와 아베로에스(1126–1198년)는 철학과 신학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어느 것이 진리에 이르는 더 나은 수단인지 논의했다.[221] 알가잘리는 이전 이슬람 철학자들의 많은 핵심 가르침을 비판하며, 그것들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에 의존한다고 말했다.[222] 서구 철학에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1033–1109년)는 신학적 가르침과 철학적 탐구가 조화롭고 서로 보완한다고 주장했다.[223] 피에르 아벨라르(1079–1142년)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학적 권위에 반대하고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24]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년)는 경험론적 이론을 발전시켜 "감각에 나타나지 않고는 지성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225] 윌리엄 오컴이 제안한 초기 형태의 직접적 실재론에 따르면, 마음에 독립적인 대상의 지각은 중개자 없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226] 한편, 14세기 인도에서는 강게샤가 신뢰성 이론을 발전시키고 증언과 오류의 문제를 고려했다.[227] 중국에서는 왕양명(1472–1529년)이 지식과 행동의 통일성을 탐구하여 도덕적 지식은 타고나는 것이며 사적 이익을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228]
3. 2. 근대 인식론

근대 철학은 르네 데카르트(1596–1650년)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철학이 확실한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고자 했으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주장이 그러한 예라고 생각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229]
데카르트는 바뤼크 스피노자(1632–1677년),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1646–1716년)와 함께 합리론 학파에 속했는데, 이들은 경험과는 독립적인 타고난 관념을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230] 반면, 존 로크(1632–1704년)는 모든 관념이 감각 경험에 의존한다는 경험론을 주장했다. 로크에 따르면 모든 관념은 감각을 통해 직접 제시되는 "감각적 관념"이거나, 감각적 관념을 반성하여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성적 관념"이다.[231]
데이비드 흄(1711–1776년)은 이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를 탐구했다. 그는 사실에 대한 지식은 결코 확실하지 않으며, 수학적 진리와 같은 관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은 확실할 수 있지만 세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232] 이마누엘 칸트(1724–1804년)는 합리론과 경험론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했다. 칸트는 흄이 간과했던 유형의 지식, 즉 모든 경험을 뒷받침하고 구성하는 원리(예: 공간 및 시간적 관계, 기본적인 이해 범주)에 대한 지식을 인정했다.[233]
데카르트는 수학·기하학 연구를 통해 얻은 개념은 의심할 여지 없는 명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기초로 철학 체계를 확립하려고 했다. 그는 합리적인 학문적 지식조차 의심하는 전면적인 회의주의에 대해 방법적 회의론을 주장하며, 육체를 포함한 모든 외적 사물이 회의의 대상이 된 후,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화된 정신만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주장은 형이상학의 중심 과제를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식에 관한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리스토텔레스적 학문 전통에서는 인식론과 진리론이 존재론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데카르트가 인식론을 존재론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
3. 3. 현대 인식론
20세기 이후 영미 철학에서는 논리 실증주의, 분석 철학, 실용주의 등이 발전하며 인식론 논의를 주도했다.[248] 에른스트 마흐의 철학과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 영향을 받은 논리 실증주의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학자들에 의해 미국과 영국으로 퍼져 영미권 현대 인식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248] 영미권에서는 과학철학과 분석철학이 발전하여 현대적 경험론의 입장을 세웠으며, 지식, 정당화, 회의주의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248]프랑스 철학에서는 현상학,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등이 인식론에 영향을 미쳤다.[248] 미셸 푸코에 따르면, 프랑스 철학은 가스통 바슐라르, 조르주 캉기렘 등의 '지식, 이성, 개념의 철학'과 장 폴 사르트르, 모리스 메를로 퐁티 등의 '경험, 감각, 주체의 철학'으로 나뉘었다.[248] 구조주의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일반 이론, 계량적 접근, 범주화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문화의 영향을 지적하고 진보 개념에 대한 회의를 제기했다.[248]
독일 철학에서는 해석학, 비판 이론 등이 인식론적 논의를 이어갔다.[248] 제2차 세계 대전 후 마르틴 하이데거의 영향으로 철학적 침체기가 있었으나, '독일 사회학의 실증주의 논쟁' 이후 영미권 언어철학과 과학철학의 성과를 수용하는 흐름이 강해졌다.[248] 카를-오토 아펠 등이 이러한 흐름에 속하며, 한스-게오르크 가다머와 같이 독일 철학 전통을 고수하는 학자들도 있었다.[248]
4. 인식론의 주요 학파 및 이론
철학적 인식론의 첫 번째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사물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기원 문제이다.[248]
인식론은 지식의 기원, 구조, 정당화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학파와 이론으로 분류된다. 주요 학파 및 이론은 다음과 같다.
- '''합리론과 경험론''': 인간 지식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경험론은 감각 경험을, 합리론은 이성을 지식의 주된 원천으로 강조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통합하여, 관념의 발생은 경험과 함께하지만 모든 관념이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기초주의와 정합론''': 지식의 구조에 대한 논쟁으로, 기초주의는 기본적 신념과 비기본적 신념을 구분하고, 기본적 신념이 지식의 토대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합론은 모든 신념이 상호 의존하며, 정합성을 통해 정당화된다고 본다.
-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정당화의 근원에 대한 논쟁으로, 내재주의는 개인 내부의 요소에, 외재주의는 개인 외부의 요소에 의해 정당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신뢰주의는 신념과 진리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강조하는 외재주의적 이론이다.
- '''회의주의''': 지식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소크라테스와 데카르트 등이 대표적인 회의론자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나 토머스 쿤, 칼 포퍼의 논리실증주의는 회의주의에 대항하는 대표적인 관점이다.
- '''기타 학파 및 이론''':
- '''덕 인식론''': 지적 덕목을 통해 신념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외재주의적 인식론이다.
- '''사회 인식론''': 지식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한다.
- '''페미니스트 인식론''': 페미니즘 관점에서 지식 생산과 정당화를 탐구한다.
- '''자연화된 인식론''': 윌라드 반 오먼 콰인이 제안한 것으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인식론을 연구한다.
- '''발생적 인식론''': 장 피아제가 제창한 것으로, 인식 발달 단계를 통해 인식이 구성적이라고 보았다.
- '''진화론적 인식론''': 콘라트 로렌츠와 칼 포퍼가 주장한 것으로, 지식의 변화를 진화로 본다.
4. 1. 합리론과 경험론
임마누엘 칸트는 인식에 대하여 a priori|선험la과 a posteriori|후험la으로 구분하였다.[299] 칸트는 영국의 경험론과 달리 경험을 처음 생길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곧바로 정신 속으로 들어와 구성되는 개별 요소가 아니라 복합적인 세계 자체로서 파악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경험은 소재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가 결합할 때에야 비로소 정신 속에서 종합된다.[300]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따르면 지식은 선험적인 아 프리오리와 후험적인 아 포스테리오리로 나뉘며, 경험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선험적 지식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경험에 따라 순차적으로 획득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식의 존재 자체는 경험과 무관한 것이다. 칸트는 시간, 공간, 범주와 같은 형식적 개념을 선험적 지식의 예로 들었다. 즉, 개인은 시간과 공간을 경험과 함께 인식할 수밖에 없으나 그 자체는 개인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301] 칸트는 후험적 지식, 즉 아 포스테리오리란 선험적으로 놓여 있는 사상(事相) 그 자체를 오성과 감성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결국 우리는 경험 그 자체를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의미가 된다.경험론과 합리론 사이의 논쟁은 인간 지식의 기원에 중점을 둔다. 경험론은 감각 경험이 모든 지식의 주된 원천이라고 강조한다. 일부 경험론자들은 마음이 백지 상태이며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는 감각 자료를 통해서만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킨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마음은 인상을 비교하고, 결합하고, 일반화하여 더 추상적인 개념에 도달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추론함으로써 다양한 추가적인 통찰력에 도달할 수 있다. 경험론자들은 이러한 모든 정신 작용은 감각으로부터 나온 자료에 의존하며 스스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113]
합리론자들은 일반적으로 감각 경험을 지식의 한 원천으로 받아들이지만,[114] 그들은 또한 중요한 형태의 지식이 감각 경험 없이 이성으로부터 직접 온다고 말한다.[115] 예를 들어 수학과 논리학 분야의 지식과 같다.[116] 일부 합리론자들에 따르면, 마음은 감각의 도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타고난 관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합리적 직관이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인식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비경험적 지식을 얻는다고 주장한다.[117] 일부 합리론자들은 개념의 기원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여 마음이 타고난 범주에 의존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경험을 체계화한다고 말한다.[115]
이마누엘 칸트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대에, 관념의 발생이 경험과 함께한다는 것은 명확하다면서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반대로 모든 관념이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경험주의를 비판하여, 두 학파의 대립을 통합했다는 견해가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칸트의 입장은 이처럼 경험적 실재론에서 출발하여, 초월론적 관념론에 이른다는 역설적인 것이다.
칸트는 표상()을 자신의 인식론 체계의 중심에 두었다. 칸트는 표상 자체는 설명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한 뒤, 표상 일반에는 그 하위 범주에 의식을 수반하는 표상이 있으며, 그 하위에는 두 종류의 지각, 주관적 지각=감각과, 객관적 지각=인식이 있다고 했다. 인간의 인식 능력에는 감성과 오성의 두 가지 인식 형식이 선험적으로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주관적 지각과 객관적 지각에 각각 대응한다. 감각은 직관에 의해 일종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식은 오성의 작용에 의해 자발적으로 사고한다. 의식은 감성과 오성의 종합에 의해 처음으로 「어떤 대상」을 표상하지만, 이것이 현상을 구성한다. 이러한 생각을 그는 스스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불렀다. 칸트에 의하면, 시간, 공간, 인과관계 등 제한된 소수의 개념은 인간의 사고에 미리 갖춰진 것이며, 그러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경험을 통해 주어진 인식 내용을 처리하여 더욱 개념이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인간 사고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4. 2. 기초주의와 정합론
기초주의와 정합론은 지식의 구조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118] 기초주의는 기본적 신념과 비기본적 신념을 구분한다. 기본적 신념은 다른 신념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그 타당성이 직접적으로 정당화되는 신념이다. 반면 비기본적 신념은 다른 신념에 의해 정당화된다.[121] 예를 들어, 어젯밤에 비가 왔다는 신념은 길이 젖어 있다는 관찰로부터 추론되는 경우 비기본적 신념이다.[122] 기초주의에 따르면, 기본적 신념은 다른 모든 지식이 쌓여 있는 토대이며, 비기본적 신념은 이 토대 위에 놓인 상부 구조를 구성한다.[121]정합론은 기본적 신념과 비기본적 신념의 구분을 거부하고, 모든 신념의 정당화는 다른 신념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정합론자들은 신념이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신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념이 일관성이 있고 서로를 지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정합론에 따르면, 정당화는 상호 연결된 웹과 유사한 전체 신념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전체론적 측면이다.[123]
4. 3.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신뢰주의와 같은 입장에서는 "새로운 악마 문제"를 내재주의적 인식론의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한다. 만일 사악한 악마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모두가 신뢰하고 동일하게 경험하는 어떤 주제가 실은 사악한 악마의 체계적 조작이라면 그 주제에 대한 모든 신념 역시 거짓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객관적 실체인지 아니면 악마의 농간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289] 신뢰주의에 따르면 각 개인의 신념에 대한 정당화가 모두 동일한 방식의 합리적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이러한 악마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결론처럼 인식은 내면적 사고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신뢰주의의 주장이다.[289]인식론에서 근세 이후 계속되어 온 내재주의에 반대하는 외재주의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출현하였다. 외재주의에서는 "사실"이 신념을 가진 사람과 독립적인 외부에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념의 정당화에서 사실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수용, 또는 이성에 대한 선험적인 정신 상태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290] 암스트롱은 지식에 대한 온도계 모델을 제시하면서 한 믿음이 지식인가 아닌가는 그 믿음을 구성하는 인지 체계가 정상적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인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온도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온도를 가리키면 이는 외부 온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듯이, 우리의 지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빙성 있게 표상하면 그것이 지식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인식론이 자연과학과 단절되어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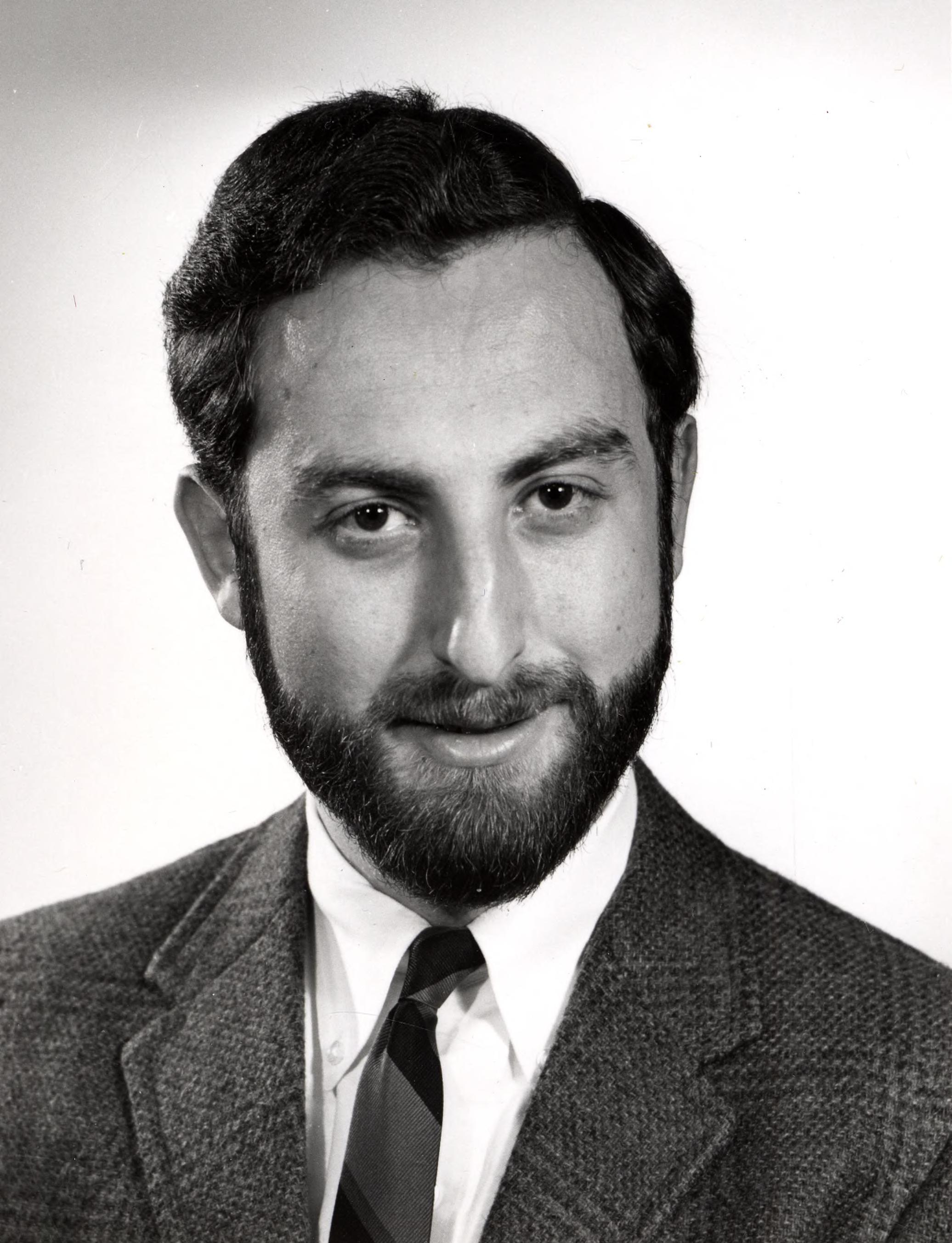
내재주의와 외재주의의 논쟁은 정당화의 근원에 관한 것이다.[126] 내재주의자들은 정당화가 개인 내부의 요소에만 의존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요소의 예로는 지각 경험, 기억, 그리고 다른 신념의 소유 등이 있다. 이 관점은 개인의 정신 상태라는 형태로 개인의 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관련 요소가 접근 가능하다는 생각과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즉 개인이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정당화된 신념을 갖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28]
외재주의는 이러한 관점을 거부하며, 적어도 일부 관련 요소는 개인의 외부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개인의 인지적 관점이 덜 중요해지는 반면, 특히 진리와의 관계와 같은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128]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신념을 고려할 때, 외재주의자들은 이 신념으로 이어진 지각 경험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력의 질, 다른 음료와 커피를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컵을 관찰한 상황도 고려한다.[129]
신뢰주의는 정당화를 위해 신념과 진리 사이의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외재주의적 이론이다.[133] 일부 신뢰주의자들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신념이 지각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신념 형성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면 그 신념은 정당화된다. 신념 형성 과정은 그것이 야기하는 대부분의 신념이 참일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약간 다른 관점은 신념 형성 과정이 아니라 신념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제시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면 신념이 정당화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신념이 사실을 추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만, 그렇지 않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134]
4. 4. 회의주의
회의주의는 인류 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회의주의는 특정한 철학 학파라기보다는 인식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 과정에서 유도된 입장이다. 가장 오래된 회의론자로 소크라테스를 꼽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확실히 아는 것이 없다는 것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론을 거쳐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의심할 수 없는 명제로 선언하였다.[307]기초주의와 여타 학파에서는 회의주의에 대항하여 이른바 "퇴행문제"를 제기한다. 윌리엄 제임스의 실용주의는 정합론으로 회의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제임스는 진리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진리란 합리적 준거에 의해 규범화된 상황에서 잘 구성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토머스 쿤이나 칼 포퍼와 같은 논리실증주의 철학자들은 회의주의를 무엇이 진정한 과학적 지식인가를 판단하는 도구로 바라본다.[307]
철학적 회의주의는 인간이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회의주의자들은 특정 지식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의 비판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종교적 회의주의자들은 신이나 다른 종교 교리의 존재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회의주의자들은 도덕적 지식의 존재에 도전하고, 형이상학적 회의주의자들은 인간이 궁극적인 실재를 알 수 없다고 말한다.[102]
전반적 회의주의는 회의주의의 가장 넓은 형태로, 어떤 영역에도 지식이 없다고 주장한다.[103] 고대 철학에서 이 관점은 아카데미아 학파의 회의주의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피론 학파의 회의주의자들은 믿음의 유보를 권장하여 평정심의 상태에 도달했다.[104] 전반적으로, 많은 인식론자들이 전반적 회의주의를 명시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입장의 영향은 주로 다른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이 회의주의의 도전을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르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사용하여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을 찾았다.[105]
전반적 회의주의를 지지하는 한 가지 고려 사항은 꿈 논증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꿈을 꿀 때 보통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관찰로 시작한다. 꿈과 일반적인 경험을 구별할 수 없는 이러한 무능력은 사람이 꿈을 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이 없다는 주장에 사용된다.[106] 일부 비평가들은 전반적 회의주의가 지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지식 주장이기 때문에 자기모순적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반론은 회의주의로 이어지는 추상적 추론이 상식을 무시할 만큼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108]
오류가능주의는 회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다.[109] 오류가능주의자들은 회의주의자들과 절대적 확실성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한다. 대부분의 오류가능주의자들은 지식이 절대적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회의주의자들과 지식의 존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110] 그들은 철저히 검증된 과학 이론과 같은 잘 확립된 지식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열린 마음과 호기심 많은 마음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111]
인식상대주의는 관련된 견해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식적 기준이나 절대적 원리가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즉,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은 인식적 지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주관적 기준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달라진다.[112]
회의주의, 특히 데카르트의 "기만적인 신"(Dieu trompeur|기만적인 신프랑스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근현대를 통틀어 인식론의 큰 과제이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제안되어 왔다.
이미 살펴본 외재주의는 지식 또는 정당화의 조건으로서, 인식 주체 자신이 반성적 접근을 가지지 않는 요소를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데카르트의 기만적인 신에게 속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 주체가 증명할 수 없더라도, 현실 세계의 상태나 인식 주체의 인지 과정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폐쇄 원리(closure principle)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된) 데카르트의 회의론이 의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원리 중 하나로, 인식 주체가 A를 알고 있으며, A에서 B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인식 주체는 B를 안다는 원리이다.[263] 다시 말해, 지식은 기존 지식의 논리적 함의 아래에서 닫혀 있다. 폐쇄 원리를 부정한다면, 속이는 신에게 속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양립 가능하다. 폐쇄 원리라고 불리는 것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원리가 옳은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식론에서 광의의 문맥주의(contextualism)는, 매우 대략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정당화되고 무엇이 지식인지는 문맥에 따라 변화한다는 견해이다. 속이는 신에 대해 생각하는 문맥과 보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문맥을 구분함으로써, 데카르트적 회의가 일상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존 L. 오스틴이 제창자 중 한 명이다.
4. 5. 기타 학파 및 이론
덕 인식론은 지적 덕목을 나타내는 신념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외재주의적 인식론의 한 형태이다. 지적 덕목은 인지 기능을 수행하고 사람들이 참된 신념을 형성하도록 돕는 능력이나 특성으로, 시각, 기억, 자기 성찰 등이 그 예시이다.[135]사회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식론의 한 분야이다. 사회적 차원은 증언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긍정적인 측면과, 선전의 확산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16]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페미니즘의 관점과 가치를 인식론에 도입하는 접근 방식이다. 성별, 권력 관계, 사회적 불평등이 지식 생산과 정당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Naturalized epistemology영어자연화된 인식론은 윌라드 반 오먼 콰인이 제안한 것으로,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인식론을 연구하려는 입장이다. 콰인은 고전적인 경험주의에는 두 가지 독단이 있으며, 독단 없는 새로운 경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론에 입각하여 경험에 의한 수정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면제받는 신념은 없으며, 상반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을 때 어떤 경험으로도 그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부정되는 일은 없고, 어떤 신념이라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장 피아제는 Genetische Epistemologiede발생적 인식론을 제창했다.[264] 그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유아의 인식 발달 단계를 밝힌 후, 인식은 대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 결코 대상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대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콘라트 로렌츠는 칼 포퍼와 함께 인간 인식의 기원 문제를 생물종으로서의 인간의 인지 구조에서 찾고, 지식의 변화를 진화로 보는 진화론적 인식론을 주장했다.
5. 인식론의 응용 분야
인식론은 과학, 윤리학, 종교,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일부 인식론 분과는 특정 학문 분야 내의 지식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수학 인식론은 수학적 지식의 기원을 연구하고, 수학 이론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탐구하면서 증명의 역할과 수학적 지식에 경험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156] 논리학 인식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논증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예를 들어 논리학자들이 긍정식 삼단논법이 올바른 추론 규칙이거나 모든 모순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탐구한다.[157] 형이상학 인식론자들은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지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지식의 근원이 무엇일 수 있는지 조사한다.[158]
특정 지식 원천에 전념하는 고유한 인식론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 지각의 인식론,[172] 기억의 인식론,[173] 증언의 인식론이 있다.[174]
일부 인식론 분과는 연구 방법으로 특징지어진다. 형식 인식론은 지식의 본질을 조사하기 위해 논리와 수학에서 발견되는 형식적 도구를 사용한다.[175] 실험 인식론자들은 일반적인 지식 관행에 대한 경험적 증거에 연구를 의존한다.[177] 응용 인식론은 인터넷에서의 지식 주장의 신뢰성, 성폭행 주장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인종차별이 인식론적 불의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과 같이 다양한 현실 세계 문제에 인식론적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178]
자연주의적 인식론은 자연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그 방법과 이론에 의존한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자들은 경험적 관찰에 초점을 맞춰 이론을 공식화하고, 선험적 추론으로 진행되는 인식론적 접근 방식을 종종 비판한다.[166] 진화 인식론은 인식을 진화의 산물로 이해하는 자연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지식과 그것을 담당하는 인지 능력을 조사한다.[167] 언어 인식론자들은 언어적 지식의 본질을 탐구한다. 그들의 주제 중 하나는 암묵적 지식의 역할인데, 예를 들어 원어민이 문법 규칙을 숙달했지만 그 규칙을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168] 양상 인식론자들은 가능하고 필요한 것에 대한 지식의 본질을 조사한다.[169] 어떤 주제에 대해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른 경우 발생하는 인식론적 문제는 불일치의 인식론에서 다룬다.[170] 무지의 인식론자들은 인식론적 결함과 지식의 격차에 관심이 있다.[171]
후기인식론자들은 인식론의 본질, 목표 및 연구 방법을 조사한다. 메타이론으로서, 어떤 인식론적 이론이 정확한지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옹호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본 개념과 배경 가정을 조사한다.[180]
19세기까지는 인식론과 심리학이 별개의 학문 분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지식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오늘날의 학문적 범주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182] 현대의 두 학문 모두 신념과 그 형성 및 변화에 책임이 있는 정신 과정을 연구한다.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심리학이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를 설명하여 특정 신념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반면, 인식론은 신념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특정 경우에 신념이 정당화되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183] 인식론은 정신적 사건을 정보를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인지과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84] 인공지능은 지식 표상 및 자동 추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현하기 위해 인식론과 인지과학의 통찰력에 의존한다.[185]
결정 이론과 인식론은 모두 합리적 사고의 기초와 신념의 역할에 관심이 있다. 인식론의 많은 접근 방식과 달리, 결정 이론의 주요 초점은 이론적 측면보다 실용적인 측면에 있으며, 신념이 행동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탐구한다.[192] 결정 이론가들은 의사 결정에 수반되는 추론과 좋은 의사 결정의 기준을 조사한다.[193] 그들은 신념을 의사 결정의 중심적 측면으로 확인한다. 그들의 혁신 중 하나는 약한 신념과 강한 신념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불확실성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194]
인식론과 교육은 지식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 가지 차이점은 교육이 학습자와 교사의 역할을 탐구하면서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195] 학습 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는지 조사한다.[196]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은 예를 들어 특정 자극에 특정 반응을 연관시킴으로써 행동 변화라는 측면에서 그 과정을 설명한다.[197] 인지주의적 학습 이론은 지식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과정이 정보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연구한다.[198] 교수학은 교사의 측면에서 지식의 전달을 살펴보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탐구한다.[199] 교사 중심 방법에서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주요 권위자의 역할을 한다. 학생 중심 방법에서는 교사가 주로 학습 과정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반면, 학생들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200] 학생들이 지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인 ''개인 인식론''은 그들의 지적 발달과 학습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201]
인류학적 지식은 지식이 어떻게 획득, 저장, 검색 및 전달되는지 조사한다. 그것은 대학 부서 및 과학 저널과 같은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면 토론 및 온라인 통신을 포함하여 지식이 재생산되고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및 문화적 상황을 연구한다. 그것은 실용적인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이해와 문화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지식을 이해한다. 인식론과 달리, 그것은 신념이 참인지 정당화되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이해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에 관심이 있다.[202] 지식 사회학은 지식에 대한 유사한 개념을 가진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이다. 그것은 물리적, 인구 통계적, 경제적 및 사회 문화적 요인이 지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그것은 어떤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지식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조건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조사한다.[203]
전통 인도 철학에는 다양한 인식론 학파가 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프라마나|प्रमाणsa라고 불리는 지식의 여러 원천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학파에서 논의되는 원천은 지각, 추론 및 증언이다. 일부 학파에서만 고려되는 다른 원천은 부재에 대한 지식으로 이어지는 비지각과 추정이다.[149] 불교 인식론은 사고와 욕망과 같은 이차적 인지 과정의 개입 없이 독특한 특수성의 제시로 이해되는 직접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150] 냐야 인식론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 형성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인식자와 지식 대상 사이의 인과 관계를 논의한다. 그것은 지각을 지식의 주된 원천으로 보고, 지각과 성공적인 행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151] 미만사 인식론은 베다로 알려진 성경을 지식의 주요 원천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그들의 올바른 해석 문제를 논의한다.[152] 자이나교 인식론은 현실은 다면적이라고 말한다. 즉, 어떤 단일 관점도 진실의 전체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53]
아프리카 인식론은 아프리카 존재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의 연속체 형태로 현실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고, 지식을 감각적, 정서적, 직관적, 합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전체론적 현상으로 이해하며, 물리적 영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154]
5. 1. 과학 인식론
자연과학의 지식 획득은 경험론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철학의 입장에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과학적 방법 역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305], 철학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진리와 달리 과학적 방법에 의한 진리는 경험적이며 귀납적인 것으로, 여기에는 반증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즉, 과학의 발전에 따라 과학 지식은 그 의미와 내용이 변할 수 있다.[306] 따라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인식되는 지식은 자가 수정이 가능한 경험적 지식 체계이다.과학 인식론은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과학적 주장을 검증하고, 정당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핵심적인 문제는 개별 관찰이 보편적인 과학 법칙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이다. 그 외 주제로는 과학적 증거의 본질과 과학의 목적이 있다.[155]
5. 2. 윤리 인식론
도덕적 진술에 대한 지식은 윤리 인식론에 속한다. 윤리 인식론은 윤리적 직관, 도덕적 신념 간의 결합성, 그리고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와 그 역할을 연구한다.[159] 신념의 윤리는 인식론과 윤리의 상호 관계를 다루는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이다. 신념의 윤리는 신념 형성을 지배하는 규범을 조사하고,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묻는다.[160]5. 3. 종교 인식론
종교 인식론은 종교적 믿음의 합리성, 신앙과 이성의 관계, 종교적 경험의 인식적 가치 등 종교적 지식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161] 종교 교리와 관행에 대한 지식과 정당화의 역할을 연구하며, 종교적 경험과 성경으로부터 얻은 증거의 무게와 신뢰성을 평가한다. 또한 이성의 규범을 종교적 신앙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다.[161]5. 4. 사회 인식론
사회 인식론은 지식의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인 인식론이 주로 개인이 소유한 지식에 관심을 갖는 반면, 사회 인식론은 집단 내에서의 지식 획득, 전달 및 평가를 다루며, 특히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할 때 서로에게 의존하는 방식에 중점을 둔다.[162]
페미니즘 인식론은 지식에 대한 성별의 영향을 비판한다. 성별에 대한 선입견이 누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지식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떤 유형의 지식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147]
포스트모더니즘 인식론은 선진 사회에서의 지식의 조건을 비판한다. 특히 과학적 지식의 끊임없는 진보에 대한 메타 내러티브에 관한 것으로, 이는 현실에 대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이해로 이어진다.[146]
탈식민주의 학문은 서구 지식 체계의 세계적 영향을 비판하며, 종종 서구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기 위해 지식을 탈식민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48]
5. 5. 역사적 인식론
서구 사회에서 인식에 대한 연구는 고대 그리스 시기의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에서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 문제를 다루고, 인식 주체로서 영혼을 탐구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와 같은 회의주의자들은 인간 인식의 한계를 논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피론의 회의주의 학파로 이어졌다. 고대 로마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 중심의 존재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계론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인간 인식 문제를 해석하려 했으며, 이는 고대 로마 철학의 주된 흐름 중 하나가 되었다. 중세에도 유럽과 아랍 지역에서 인식론이 발달하였다. 로크는 근세 인식론의 화두를 제시하였으며, 근대 인식론은 로크와 데카르트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 근대에 인식의 기원에 관한 주장으로는 이성론과 경험론이 있다. 근세에 이성론은 주로 유럽에서, 경험론은 영국에서 발달했다. 영국에서는 중세기 이후 경험론의 전통이 있었으며 로크 이후 더욱 치밀해졌다. 칸트는 이 둘을 종합하고자 선험적 관념론을 주장했다. '인식의 대상'이 관념적이라는 관념론과 실재적이라는 실재론은 인식의 본질에 관해 대립한다. 칸트의 비판주의는 인식이 경험적 실재론인 동시에 선험적 관념론이라 하여, 이 둘을 종합하려 했으나 충분히 종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 후 철학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식론도 복잡해졌다. 신칸트주의, 그리고 현상학에서는 인식론이 철학의 방법 자체가 되었다.[271]참조
[1]
서적
2024
[2]
multiref
https://books.google[...]
2005
[3]
multiref
https://books.google[...]
2005
[4]
multiref
https://books.google[...]
2018
[5]
multiref
https://books.google[...]
2021
[6]
multiref
2021
[7]
서적
https://books.google[...]
1996
[8]
multiref
https://books.google[...]
2007
[9]
multiref
2024
[10]
multiref
https://books.google[...]
2004
[11]
서적
2004
[12]
서적
2024
[13]
서적
2006
[14]
서적
2011
[15]
multiref
2022a
[16]
multiref
https://portal.findr[...]
2021
[17]
multiref
https://archive.org/[...]
1971
[18]
multiref
2005
[19]
multiref
https://books.google[...]
2005
[20]
multiref
https://books.google[...]
2021
[21]
multiref
2023
[22]
multiref
2009a
[23]
multiref
Fallibilism
https://books.google[...]
2005
[24]
서적
https://books.google[...]
2016
[25]
multiref
Knowledge
https://books.google[...]
2004
[26]
multiref
Knowledge
2023
[27]
multiref
Knowledge
1999
[28]
서적
Knowledge
[29]
multiref
https://books.google[...]
1999
[30]
서적
https://books.google[...]
2013
[31]
multiref
Knowledge
https://philpapers.o[...]
2001
[32]
multiref
Knowledge
https://books.google[...]
2013
[33]
multiref
https://plato.stanfo[...]
2022
[34]
multiref
Knowledge
2024
[35]
multiref
A Priori and A Posteriori
2020
[36]
논문
A Priori and A Posteriori
[37]
논문
A Priori and A Posteriori
[38]
서적
https://books.google[...]
[39]
서적
https://books.google[...]
[40]
논문
https://books.google[...]
[41]
논문
https://books.google[...]
[42]
논문
[43]
논문
[44]
논문
[45]
논문
[46]
논문
https://books.google[...]
[47]
논문
[48]
논문
[49]
논문
[50]
논문
[51]
논문
[52]
논문
[53]
논문
Knowledge
[54]
논문
[55]
논문
[56]
논문
https://books.google[...]
[57]
논문
https://books.google[...]
[58]
논문
https://books.google[...]
[59]
논문
https://books.google[...]
[60]
논문
[61]
논문
https://archive.org/[...]
[62]
논문
[63]
논문
[64]
논문
https://books.google[...]
[65]
논문
[66]
논문
[67]
논문
[68]
논문
[69]
논문
[70]
논문
[71]
논문
[72]
논문
[73]
논문
[74]
논문
[75]
논문
[76]
논문
[77]
논문
[78]
논문
[79]
논문
'https://books.googl[...]
[80]
논문
[81]
논문
'https://books.googl[...]
[82]
논문
'https://books.googl[...]
[83]
논문
'https://books.googl[...]
[84]
논문
[85]
논문
'https://books.googl[...]
[86]
논문
[87]
논문
'https://books.googl[...]
[88]
논문
[89]
논문
[90]
논문
[91]
논문
[92]
논문
[93]
논문
[94]
논문
[95]
논문
[96]
논문
[97]
논문
'https://books.googl[...]
[98]
논문
[99]
논문
[100]
논문
[101]
논문
[102]
논문
'https://books.googl[...]
[103]
논문
'https://books.googl[...]
[104]
논문
['https://books.goog[...]
[105]
논문
[106]
논문
Knowledge
[107]
논문
[108]
논문
https://books.google[...]
[109]
논문
[110]
논문
Fallibilism
[111]
논문
Fallibilism
[112]
논문
https://books.google[...]
[113]
논문
[114]
논문
[115]
논문
[116]
논문
https://books.google[...]
[117]
논문
https://books.google[...]
[118]
논문
https://books.google[...]
[119]
논문
https://books.google[...]
[120]
논문
[121]
논문
https://books.google[...]
[122]
논문
[123]
논문
https://books.google[...]
[124]
논문
https://books.google[...]
[125]
논문
https://books.google[...]
[126]
논문
[127]
논문
[128]
논문
[129]
논문
[130]
논문
[131]
논문
[132]
논문
[133]
논문
[134]
논문
[135]
논문
Virtue Epistemology
[136]
논문
[137]
논문
https://books.google[...]
[138]
논문
[139]
논문
[140]
논문
[141]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22, 2018]
[142]
논문
null
[2000, 1998]
[143]
논문
null
[2021, 2005, 2010]
[144]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21, 2015]
[145]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20, 2018]
[146]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18, 1991]
[147]
논문
null
[1995, 2024]
[148]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17, 2017]
[149]
논문
null
["https://books.goog[...]
[1998, 2024, 2017]
[150]
논문
null
["https://books.goog[...]
[1998, 2021]
[151]
논문
null
1998
[152]
논문
null
1998
[153]
논문
null
["https://books.goog[...]
[null, 2004]
[154]
논문
null
[2021, 2017]
[155]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19, 2010, 2020]
[156]
논문
null
["https://link.sprin[...]
[2004, 1996]
[157]
논문
null
2020
[158]
논문
null
[2020, 2023]
[159]
논문
null
[null, 2023]
[160]
논문
null
2018
[161]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19, 2023]
[162]
논문
null
[2017, 2024]
[163]
논문
null
["https://books.goog[...]
[2023, 2013, 2011]
[164]
논문
null
2011
[165]
논문
null
2011
[166]
논문
null
[2009, null, 2021]
[167]
논문
null
[2023, null]
[168]
논문
null
2003
[169]
논문
null
2021
[170]
논문
null
2023
[171]
논문
null
["https://link.sprin[...]
2015
[172]
논문
null
2014
[173]
논문
null
1998
[174]
논문
null
["https://www.jstor.[...]
2004
[175]
논문
null
2014
[176]
논문
[177]
논문
[178]
논문
[179]
논문
[180]
논문
[181]
논문
[182]
논문
[183]
논문
https://books.google[...]
[184]
논문
[185]
논문
[186]
논문
https://books.google[...]
[187]
논문
https://books.google[...]
[188]
논문
https://books.google[...]
[189]
논문
[190]
논문
[191]
논문
https://books.google[...]
[192]
논문
[193]
논문
[194]
논문
[195]
논문
[196]
논문
[197]
논문
[198]
논문
[199]
논문
[200]
논문
[201]
논문
https://link.springe[...]
[202]
논문
https://onlinelibrar[...]
[203]
논문
[204]
논문
[205]
논문
[206]
논문
[207]
논문
[208]
논문
[209]
논문
[210]
논문
[211]
논문
[212]
논문
https://books.google[...]
[213]
논문
https://books.google[...]
[214]
논문
[215]
논문
https://books.google[...]
[216]
논문
[217]
논문
[218]
논문
[219]
논문
[220]
논문
https://books.google[...]
[221]
논문
https://books.google[...]
[222]
논문
https://books.google[...]
[223]
논문
https://books.google[...]
[224]
논문
[225]
논문
[226]
논문
https://books.google[...]
[227]
논문
[228]
논문
[229]
논문
[230]
논문
https://books.google[...]
[231]
논문
[232]
논문
https://books.google[...]
[233]
논문
[234]
논문
[235]
논문
[236]
논문
[237]
논문
https://books.google[...]
[238]
논문
[239]
논문
[240]
논문
[241]
논문
[242]
논문
[243]
논문
https://books.google[...]
[244]
논문
[245]
논문
[246]
논문
[247]
논문
https://books.google[...]
[248]
웹사이트
認識論
https://kotobank.jp/[...]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コトバンク)
2019-06-10
[249]
일반텍스트
[250]
일반텍스트
[251]
일반텍스트
[252]
일반텍스트
[253]
일반텍스트
[254]
웹사이트
実在論
https://kotobank.jp/[...]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コトバンク)
2019-06-10
[255]
웹사이트
観念論
https://kotobank.jp/[...]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コトバンク)
2019-06-10
[256]
일반텍스트
伊藤 (2007)
[257]
일반텍스트
熊野 (2002)
[258]
서적
岩波哲学・思想事典
[259]
웹사이트
真理
https://kotobank.jp/[...]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コトバンク)
2019-06-10
[260]
일반텍스트
セラーズ (2006)
[261]
일반텍스트
戸田山 (2002)
[262]
일반텍스트
戸田山 (2002)
[263]
일반텍스트
戸田山 (2002)
[264]
서적
Psychology
Wiley-Blackwell
[265]
백과사전
Epistemology
Encyclopedia Britannica
[266]
웹사이트
Epistemology
https://web.archive.[...]
G & C. Merriam Co.
[267]
웹사이트
Epistemology
http://plato.stanfor[...]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4-03-01
[268]
백과사전
Epistemology
Macmillan
[269]
백과사전
Encyclopaedia Britannica Online
[270]
저널
Epistemology
[271]
백과사전
인식론 - 일원론·이원론
글로벌 세계 대백과
[272]
서적
Essays on Knowledge, Mind, and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73]
서적
칸트의 비판철학
민음사
[274]
서적
역사학의 철학
민음사
[275]
서적
지식을 위한 철학 통조림 - 고소한 맛
주니어김영사
[276]
서적
지식을 위한 철학 통조림 - 고소한 맛
주니어김영사
[277]
서적
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철학을 배웠나
삼인
[278]
서적
철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279]
서적
존재의 철학자 하이데거 VS 의미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숨비소리
[280]
서적
나는 왜 그리고 어떻게 철학을 배웠나
삼인
[281]
서적
21세기 객관적 관념론
에코리브르
[282]
서적
교과교육과 초등과학교육론
학문사
[283]
서적
자연주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84]
저널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http://fitelson.org/[...]
[285]
서적
지식역사
한국경제신문사
[286]
서적
Philosophical Explanations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Press
[287]
서적
Belief, Truth and Knowledge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8]
서적
Epistemology
Blackwell
[289]
웹사이트
The New Evil Demon Problem
http://www.iep.utm.e[...]
[290]
서적
Externalist Theories of Empirical Knowledge
Blackwell
[291]
간행물
자연화된 인식론과 인식 규범의 자연화
http://www.analyticp[...]
[292]
서적
Five Dialogues
Hackett Pub. Co.
[293]
웹인용
The Value of Knowledge
http://plato.stanfor[...]
2016-02-24
[294]
저널
Recent Work on Epistemic Value
http://www.jstor.org[...]
[295]
저널
The Search for the Source of Epistemic Good
[296]
서적
Epistemic Value
Oxford University Press
[297]
서적
The Value of Knowledge and the Pursuit of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8]
서적
The Value of Knowledge and the Pursuit of Understan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9]
서적
선험적 관념론의 세계
지만지
[300]
서적
개정판 서양 철학사
을유문화사
[301]
서적
내가 사랑하는 철학자 - 소크라테스에서 슬로터다이크까지
말글빛냄
[302]
서적
존재의 철학자 하이데거 VS 의미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숨비소리
[303]
서적
나는 누구인가
21세기북스
[304]
서적
논쟁과 철학
고려대학교출판부
[305]
뉴스
People start off with a belief and a prejudice—we all do. And the job of science is to set that aside to get to the truth.
http://www.wired.com[...]
2010-08-30
[306]
서적
교과교육과 초등과학교육론
학문사
[307]
서적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ume 7
Macmillan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