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본성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인간 본성은 철학, 종교,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탐구되는 주제로, 인간의 특징, 행동,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과 영혼의 조화, 플라톤의 이원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정의 등이 논의되었으며, 소크라테스 학파는 인간 본성을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보았다. 중국 철학에서는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법가의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 등이 대립했다.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에는 기독교 신학과 고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의지가 강조되었다. 현대 철학에서는 자연주의, 유물론, 합리주의가 인간을 자연 현상으로 보고, 아브라함 종교는 영적인 존재로, 다신교와 애니미즘에서는 초자연적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한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인간 본성을 진화의 결과로 설명하며, 본능적 행동과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자유 의지와 결정론, 자연주의와 영성주의, 도덕성, 인생의 의미 등 다양한 철학적 문제들이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로 보며, 구원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과학적 연구는 유전자, 뇌 발달, 사회경제적 환경 등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진화 심리학은 보편적인 행동 경향을 연구한다.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관심을 천문 연구에서 인간으로 돌리면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13] 서구 사상사에서 오랫동안 인간 본성은 신과 연결되거나, 이데아처럼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궁극적이고 정교하며 불변하는 자연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간의 고유한 이성을 사용하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2. 역사적 배경
그러나 불변하는 인간 본성의 존재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근대 이후 중요한 변화를 맞이했다. 루소는 인간의 높은 순응성을 강조하며 본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제시했다. 그는 인간이 본래 고독했으며 정치, 이성, 언어 등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서구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루소는 인간 본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성이나 도덕과는 거리가 먼 본능적 감정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는 19, 20세기까지, 특히 칸트, 헤겔, 마르크스에게 큰 영향을 남겼다.
다윈 역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본성이 있지만, 그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현대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헤겔, 마르크스, 니체, 사르트르와 같은 사상가들과 사회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고정된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과학적 관점에서도 행동주의, 결정론, 정신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본성의 기원과 작동 방식에 대한 상반된 모델을 제시하며, 인간이 가진 가소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 본성은 타고난 불변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 1. 고대 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서구의 사물 본성에 대한 개념의 궁극적인 기원으로 여겨진다.[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주요 관심사를 천문 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로 전환시킨 인물이다.[13] 비록 소크라테스 자신이 남긴 저술은 없지만, 그는 인간이 어떻게 가장 훌륭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크세노폰,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합리주의자였으며 이성을 사용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자 인간 본성에 가장 적합한 삶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 학파의 이러한 생각은 중세 시대 이슬람 철학, 기독교 철학, 유대교 철학 등 여러 철학적 논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 인간 특유의 방식으로 나뉘는 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영혼은 크게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이성적인 부분은 다시 (1) 그 자체로 이성적인 능력과 (2) 이성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기개(θυμός|튀모스grc)로 구성된다. 영혼의 다른 비이성적인 부분은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욕구나 정열(ἐπιθυμία|에피튀미아grc)과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1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기개는 다른 정열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관점에서 이성적인 부분이 기개의 도움을 받아 영혼의 다른 부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영혼의 올바른 기능이며, 따라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이고, 철학자는 가장 고귀한 유형의 인간이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에 관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주장들을 펼쳤다. 그는 분할된 인간 영혼에 대한 스승의 체계를 이어받는 한편, 인간 본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성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장 특별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계발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의도"되었다는 그의 목적론적 관념은 현대사에 들어서면서 그 설득력을 많이 잃었다.[19]
소크라테스 학파에게 인간 본성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본성은 형이상학적 개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4원인설''을 통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체계화했다. 그는 모든 생명체가 네 가지 원인, 즉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질료 (ὕλη|휠레grc)
# 형상 (εἶδος|에이도스grc 또는 μορφή|모르페grc, 이데아)
# 작용 원인 (κινοῦν|키눈grc)
# 목적 원인 (τέλος|텔로스grc, 텔로스)
예를 들어, 참나무는 식물 세포(질료)로 만들어지고, 도토리(작용 원인)에서 자라며, 참나무 고유의 본성(형상)을 나타내고, 완전히 성숙한 참나무(목적)로 성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형상 원인의 한 예이며,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한 인간, 즉 마음의 완전한 실현을 포함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인간 지성( νοῦς|누스grc)이 "부피는 가장 작지만"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무엇보다도 길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 따라서 철학자의 학습과 지적 성장은 가장 행복하고 고통이 적은 삶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한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성의 중요성과 인간의 삶을 탐구하는 자세를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형이상학적, 인류학적 사유를 발전시켰다. 그에게 인간은 머릿속에 지성을 가진 영혼이 깃든 존재였고, 육체는 탐욕스러운 짐승과 같았다. 영혼의 임무는 이 짐승 같은 육체를 제어하고, 결국 죽음을 통해 이 불쾌한 공존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 플라톤의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독교 신학에 깊이 스며들었다.
2. 2. 중국 철학

인간 본성은 중국 철학에서 중요한 논쟁거리였다.[21] 특히 송나라 이후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이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22] 이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본 순자의 성악설과 대조를 이룬다.[23]
=== 유교 ===
==== 맹자: 성선설 ====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했다.[24][21][25] 그는 인간 본성을 타고난 경향성으로 보았는데, 이는 적절한 환경 속에서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29] 따라서 모든 인간이 현실에서 선한 것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선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29]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는 네 가지 선한 단서(端|duan중국어)[26]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인 정동적 동기나 직관적 판단으로 나타난다.[26]
맹자는 이러한 네 가지 단서를 사유(思, 思|si중국어)를 통해 발전시킴으로써 인(仁), 의(義), 예(禮), 지(智)라는 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25] 사유는 덕이 감각적 만족보다 우선함을 깨닫게 하지만, 사유가 부족하면 도덕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26] 즉, 인간은 선으로 나아가려는 감정적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25]
맹자는 인간이 악하게 되는 것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하거나 외부 환경에 의해 본성이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5] 그는 감각적 욕구 역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지만, 네 가지 단서와는 구별된다고 보았다.[26] 윤리적 동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으므로,[25] 네 가지 단서에 대해 깊이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때 사유는 귀나 눈이 아닌 마음의 기능이다.[27] 맹자는 인, 의, 예, 지가 내면의 자질이므로, 인간은 단순히 사리사욕만을 추구해서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28] Wong (2018)은 맹자가 인간 본성을 선하다고 본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며, 올바른 양육 조건에서 인간에게 감각의 욕망에 적절한 강조를 줄 수 있는 직관적 규범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향을 포함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26]
==== 순자: 성악설 ====
순자(순황)는 인간 본성을 태어날 때부터 지닌 기본적인 능력, 역량, 욕구로 이해했다.[29] 그는 인간의 본성이 교육받기 이전의 동물적 본능, 즉 탐욕, 나태함, 욕망과 같다고 보았다.[34] 이러한 본능은 없앨 수 없기에, 교육을 통해 선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4]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모든 선은 후천적인 인간 활동의 결과라고 단언했다.[21][30] 인간은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익을 탐하게 된다.[30] 그는 "이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올바르게 되고 예의와 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승과 법에 의존해야 하며, 그 후에야 훈련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21] 순자는 선이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습득되는 특성과 습관, 즉 인위(偽|wei중국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31][29] 따라서 도덕성은 인간의 인위적 노력의 산물이지만, 본성의 일부는 아니라고 보았다.[32] Ivanhoe (1994)에 따르면,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파괴적인 경쟁을 막기 위해 학습을 통해 도덕성을 습득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33]
=== 법가 ===
법가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34] 이 철학의 추종자들은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타고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이 그러한 본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37]
법가주의자들은 대다수의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다.[37][36] 그들은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36] 그들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37] 예를 들어,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관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35] 끊임없는 정치적 투쟁이 존재하며, 이는 경쟁하는 인간 행위자와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여기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에 쉽게 유혹된다.[36]
법가에 따르면, 인간 본성의 이기심은 교육이나 자기 수양으로 제거하거나 바꿀 수 없다.[37][38] 그것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고, 사람들이 도덕적 헌신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극히 드물게 여긴다.[37] 법가주의자들은 통치자나 피통치자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지 않았다.[37] 대신, 한비자와 같은 법가 사상가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명확하고 비인격적인 규범과 기준(예: 법, 규정 및 규칙)을 강조한다.[37]
한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본성의 핵심 특징은 인간이 이기적이지만 그들의 욕망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38] 그는 이러한 본성 때문에 희소성의 시대에 외부 재화에 대한 경쟁이 무질서를 낳는다고 주장한다.[38] 희소성이 없다면, 인간은 서로를 잘 대할 수 있지만, 친절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희소성이 없을 때 무질서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38] 한비자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변함없는 이기적인 핵심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아 누구에게서든 이점을 얻고 싶어하며, 이는 사람들이 면책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히 표현된다고 주장한다.[38]
법가주의자들은 인간 본성의 이기심이 국가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37] 법가에서는 정부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엘리트의 모든 구성원은 -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고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7] 여기서 개인은 국가의 필요에 모순되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해야 한다.[37] 따라서 이러한 인간 이기심을 전제로 하는 정치 체제가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체제이다.[37] 반대로, 신뢰와 존경(비인격적인 규범과 기준이 아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는 진행 중이며 해결할 수 없는 권력 투쟁과 관련하여 큰 우려를 낳는다.[37]
법가주의자들은 보상과 처벌을 통해 달성되는 통제가 통치의 기초라고 제안한다.[34] 그들은 보상과 처벌의 사용을 효과적인 정치적 통제로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본성에 있기 때문이다.[36] 예를 들어, 법가 정치가인 상앙에 따르면, 법이 제정될 때 보상과 처벌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성향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37]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한 이점에 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이러한 것들을 쓰라리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농업이나 전쟁의 추구로 인도될 수 없지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추구로 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37] 인간 본성의 이기심에 대해, 한비자는 "신하로 행동하는 자들은 처벌을 두려워하고 보상을 통해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한다.[38]
한비자의 견해에 따르면,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은 실제 ''군자''(君子, 유교에서 덕망있는 모범)가 아니라 ''군자''와 동등한 것을 생산하는 정치 체제이다.[38] 그러나 이것은 한비자가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본질"의 선함을 구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38] 오히려,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개인의 자기 이익에 부합한다면(즉, 서로 다른 이익이 서로 정렬되고 사회적 선에 부합한다면) 인간이 사회 질서를 낳도록 행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범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시행될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보장된다.[38]
2. 3. 중세 및 르네상스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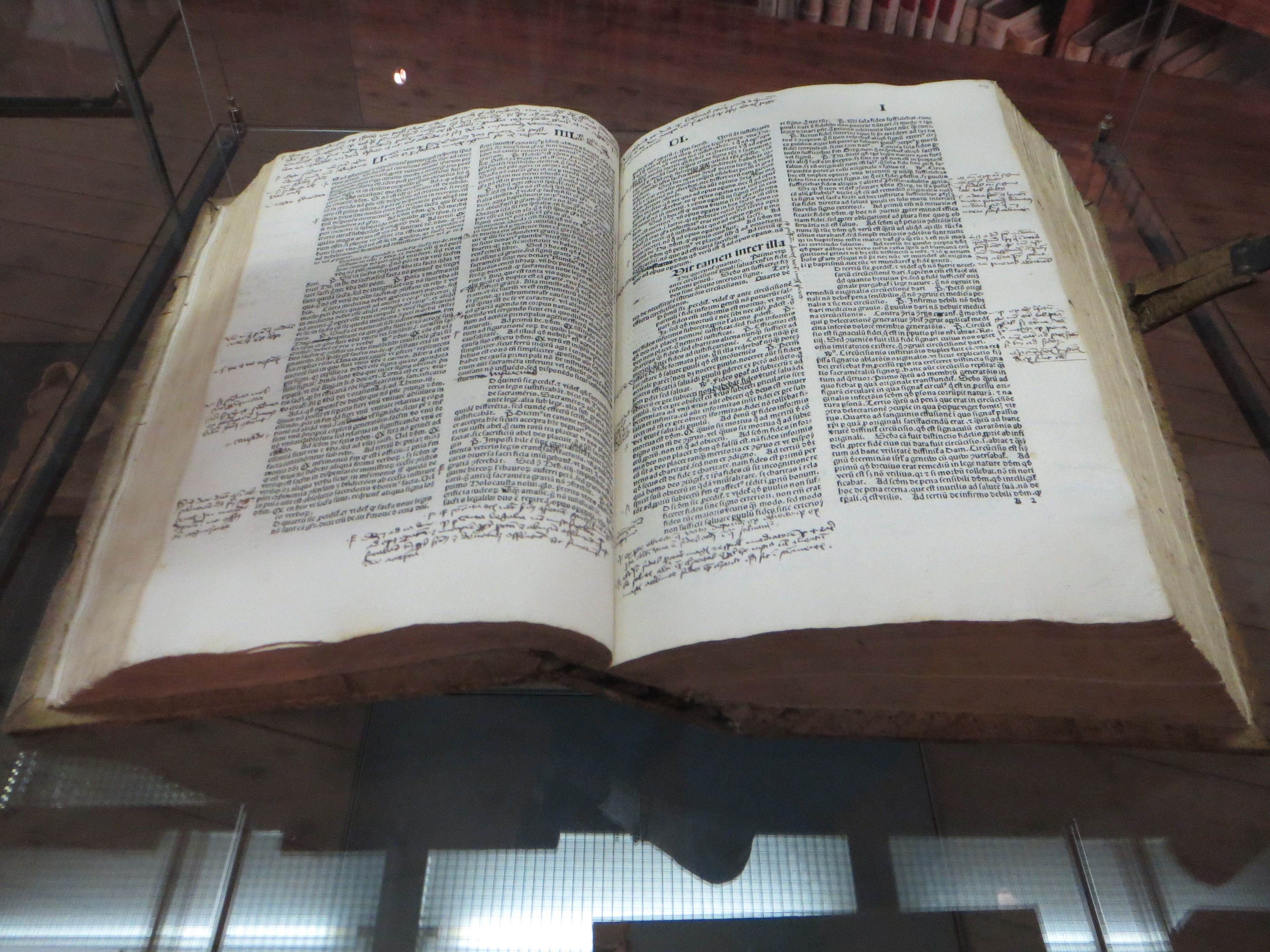
중세 시대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성경과 고전 철학 전통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과 지혜서 2장 23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고 언급하며, 이는 중세 신학자들이 인간관을 정립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으나(''De gratia et libero arbitrio'', IV, 9; IX, 28), 대다수 학자들은 이성을 통해 신과 인간의 유사성을 파악하려 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지닌 지적 본성, 즉 "스스로를 알고 사랑하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학대전'' I a, q. 93, a. 4). 보나벤투라는 모든 피조물이 신의 흔적을 지니며, 특히 지성을 부여받은 존재는 기억, 지성, 의지의 원리로서 신이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그리스도론과 하나님의 형상 교리를 독창적으로 결합하여 전통적인 구분을 넘어서고자 시도했다.
고대에서 유래한 소우주(microcosm)로서의 인간 개념 역시 중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12세기 베르나르두스 실베스트리스와 생 빅토르의 고드프리 등이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빙겐의 힐데가르트와 오토의 호노리우스는 인간("작은 세계")과 우주("큰 세계") 사이의 상응 관계를 탐구했으며, 이는 중세 의학과 사기질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대부터 내려온 "합리적 동물"이라는 인간 정의는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서유럽에 소개되고 그리스 및 아랍 철학 문헌들이 번역되면서 이 문제는 주요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보나벤투라는 영혼과 육체가 별개의 실체이며 영혼이 육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관점은 영혼의 독립성을 강조하여 영혼 불멸이라는 종교적 믿음과 잘 부합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유기체의 행위"이자 육체의 형식으로 보았는데, 이는 영혼 불멸을 설명하기에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론을 받아들여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적인 영혼은 인간이 살아있는 육체이자 동물, 그리고 인간이게 하는 형식이다(''신학대전'' I a, q. 76, a. 6, ad 1). 아퀴나스는 지적 행위가 육체 기관 없이 이루어지므로, 지성을 가진 영혼(정신)은 육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멸한다고 주장했다(''신학대전'' I a, q. 75, a. 2). 그러나 14세기에 이르러 오컴의 윌리엄, 장 뷔리당 등은 영혼 불멸에 대한 철학적 증명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15세기와 16세기 초에는 이 논쟁이 더욱 격렬해졌다.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플라톤 신학''(1474)에서 영혼 불멸을 강력히 옹호했지만, 피에트로 폼포나치(† 1525)는 불멸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재발견은 또 다른 인간 이해 방식, 즉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보는 관점을 부각시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I, 2; 1253 a 1-2)에서 제시한 이 개념은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나 단테 알리기에리 같은 사상가들을 통해 정치적 인류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인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과 의사소통 능력, 특히 언어 사용이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표현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지적했다(''De regno'', ch. 1).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요한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De divisione naturae''(제4권)에서 "인간의 실체는 그가 자신을 아는 개념"이라며 인간의 자기 인식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PL'', 122, 770A). 반면, 훗날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된 로타리오 데이 세니는 ''De Miseria Condicionis Humane''(1195-119)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비참함을 강조하며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1452년 잔노초 마네티는 인간 육체와 영혼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찬양하며 인노첸시오 3세의 견해에 반박했다.[39]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그의 유명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담론''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피코는 인간이 특정 본성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자유를 지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이 아담에게 "너 자신의 자유 의지로 너 자신을 정의하라"고 말했다고 묘사하며,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찬양했다. 이러한 인류학은 근대의 시작으로 찬양받았지만, 이 인간의 존엄성은 정확히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종교와 대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코는 전례 없는 강렬함으로 이 심오한 진실, 즉 "인간은 인간에 대한 모든 정의된 개념보다 앞선다"는 것을 빛나고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올리비에 불누아(O. Boulnois)의 지적).
3. 철학적 관점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서구에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8]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철학의 주된 관심을 천문학 연구에서 인간 자신에 대한 연구로 전환시켰다.[13] 소크라테스는 직접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어떻게 가장 훌륭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크세노폰,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합리주의자였으며, 이성을 사용하는 삶이야말로 인간 본성에 가장 적합하고 최상의 삶이라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 학파의 이러한 생각은 이후 중세 시대의 이슬람 철학, 기독교 철학, 유대교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이 고유한 방식으로 나뉘는 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영혼의 한 부분은 인간적이고 이성적인데, 이는 다시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이성을 따를 수 있는 기개(θυμός|투모스grc)를 가진 부분으로 나뉜다. 영혼의 다른 부분은 동물에게서도 발견되는 욕구나 정념(ἐπιθυμία|에피투미아grc)과 같은 감정을 담당한다.[14] 이들에게 이상적인 상태는 이성적인 부분이 기개의 도움을 받아 영혼의 다른 부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며, 철학자는 가장 고귀한 유형의 인간으로 여겨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로서 인간 본성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지고 영향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인간을 다음과 같은 존재로 규정했다.
- '''이성적 동물''':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혼(ψυχή|프시케grc) 안에 이성 또는 언어(λόγος|로고스grc)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ἔργον|에르곤grc)은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ἐνέργεια|에네르게이아grc)이다.[15] 이를 바탕으로 중세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했다.
- '''결합하는 동물''': 인간은 본성적으로 짝을 이루어 가족(οἶκος|오이코스grc)을 형성하고, 나아가 씨족이나 작은 마을을 이루도록 태어났다.[16]
- '''정치적 동물''': 인간은 더 복잡한 공동체, 즉 폴리스(그리스어: πόλις, 도시 국가)를 형성하려는 본능을 지닌다. 이러한 공동체는 법과 분업 체계를 갖추며, 단순한 대가족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도시 국가는 이성의 사용을 필요로 하며, 가부장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17]
- '''모방적 동물''': 인간은 상상력을 사용하고 모방하는 것을 즐긴다. 추한 짐승이나 시체처럼 그 자체로는 보기 괴로운 대상이라도 정확하게 묘사된 것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는 대상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추론하기 때문이다.[18]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특별한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최선을 다해 발전시켜야 할 목표이기도 했다. 그의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있지만,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목적론적 관점은 현대사에 들어서면서 그 설득력을 많이 잃었다.[19] 소크라테스 학파에게 인간 본성은 형이상학적 개념이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4원인설(질료, 형상, 작용, 목적)로 체계화했다. 그에게 인간 본성은 형상 원인에 해당하며, 인간의 목적(텔로스)은 이성을 포함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었다.[20]
중국 철학에서도 인간 본성은 중요한 논쟁거리였다.[21] 송나라 이후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이론(성선설)이 주류를 이루었다.[22] 이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본 순자의 이론(성악설)과 대조된다.[23]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며[24][21][25],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하려는 타고난 경향을 지닌다고 보았다.[29] 따라서 모든 인간은 선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29] 맹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에는 네 가지 단서(端|duānzho)가 있다.[26] 이는 각각 측은지심(惻隱之心)에서 인(仁)(仁|rénzho)으로, 수오지심(羞惡之心)에서 의(義)(義|yìzho)로, 사양지심(辭讓之心)에서 예(禮)(禮|lǐzho)로, 시비지심(是非之心)에서 지(智)(智|zhìzho)로 발전한다.[25][26] 맹자는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감정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28]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5]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며, 모든 선은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21][30]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능적인 욕망(탐욕, 나태함 등)을 본성으로 보았으며[34], 이러한 악한 본성은 교육과 예의를 통해 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1] 선은 의식적인 노력, 즉 인위(偽|wěizho)를 통해 습득되는 것이며, 도덕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았다.[31][32][29]
법가 사상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34] 법가 사상가들은 대부분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37][36], 도덕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37] 그들은 인간의 이기심이 교육이나 자기 수양으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37][38],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비자 등이 강조했듯이 명확하고 비인격적인 법과 규범, 그리고 상벌을 통한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37][34] 법가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면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37],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 추구가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37]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과 고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구절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였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이 신을 닮은 점이라고 보았다(''신학대전'' I a, q. 93, a. 4).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논쟁도 활발했는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적 입장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영혼과 육체의 통일성을 강조한 아퀴나스의 입장이 대립했다(''신학대전'' I a, q. 76, a. 6, ad 1; I a, q. 75, a. 2).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 개념이 재조명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 등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의지를 강조하며 인간 중심적인 사상을 펼치기도 했다.[39]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프랜시스 베이컨과 르네 데카르트 등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목적론적 설명을 비판하고, 보다 기계론적이고 경험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운동하는 물질로 보고,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묘사하며 강력한 국가 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83]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을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상태(타불라 라사)로 보고, 모든 지식과 관념이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84]
장 자크 루소는 홉스와 로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이 원래 이성이나 언어, 공동체 없이 고독하게 살았으며,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불행해졌다고 주장했다.[85] 루소는 원시 상태의 인간이 더 순수하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고귀한 야만인' 개념을 제시하며[86], 인간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의 사상은 이후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여러 지적, 정치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87]
데이비드 흄은 홉스나 루소처럼 인간 본성을 이기심과 같은 단일 원리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허치슨 등의 영향을 받아 인간에게 이기심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동료 의식)과 같은 사회적 감정도 중요하다고 보았다.[88] 그는 명예롭다거나 수치스럽다는 등의 도덕적 구분이 가능한 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어떤 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형이상학적 설명을 거부하고 경험적 관찰을 중시하는 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다Darwin의 진화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또 다른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다윈은 인간 역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해왔으며, 인간의 본성 역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임을 시사했다. 이는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이다. 다윈 이전에도 루소 등이 인간 본성의 가변성을 주장했지만, 다윈 이후 헤겔, 마르크스, 니체, 사르트르와 같은 사상가들과 사회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은 고정된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더욱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 심리학, 행동주의, 정신 의학 등에서도 인간의 가소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여러 모델을 제시하며, 고정된 본성이라는 관념에 도전하고 있다.
에두아르 마케리와 같은 일부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정 종류의 사물에 고유한 '본질'이 있다고 믿는 경향, 즉 민속 본질주의(folk essentialism)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의 통일된 본성을 공유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근대에 나타난 것이며, 이전에는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며 인간을 단일한 범주로 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90]
3. 1. 형이상학과 윤리학
소크라테스 학파는 인간 본성, 그리고 모든 자연의 본성을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간주했다.[19]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4원인설을 통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체계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네 가지 원인, 즉 질료(hyle), 형상(이데아), 작용인(kinoun), 그리고 목적(텔로스)을 가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의 본성은 형상 원인의 한 예이며, 인간의 '목적'은 마음의 완전한 실현을 포함하여 '완전히 현실화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20] 그는 인간 지성(νοῦς|누스grc)이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무엇보다도 길러져야 한다고 보았다.[20]중세 시대에는 성경과 고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6절과 지혜서 2장 23절은 중요한 신학적 논의의 기초가 되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이성을 통해 신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지적 본성이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신을 모방하기 때문에 '신의 형상'이라 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학대전'' I a, q. 93, a. 4). 보나벤투라는 모든 피조물이 신의 흔적이며, 지성을 가진 존재는 기억, 지성, 의지의 원리로서 신이 내재하는 '신의 형상'이라고 보았다. 한편,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논쟁거리였다. 이원론적 입장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별개의 실체로 보고 영혼이 육체를 움직인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과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혼이 육체의 형식이라고 보아 인간 존재의 통일성을 강조했다(''신학대전'' I a, q. 76, a. 6, ad 1). 그는 지적 활동이 육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학대전'' I a, q. 75, a. 2).[39]
근대 이후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을 전적으로 자연 현상의 일부로 보는 자연주의, 유물론, 합리주의적 시각이 중요하게 부상했다.[83][84] 이 관점에서는 인간이 진화와 같은 자연적 메커니즘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인문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연주의적 틀 안에서 인간 행동에 보편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정의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다른 자연주의자들은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지 특정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인지 여부에 따라 붙여지는 낙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보편적인 도덕 기준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교와 세계관 역시 인간 본성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제시한다.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아브라함 종교는 인간의 본성이 영적인 것이며, 유일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현재도 신과의 연결을 유지한다고 본다. 이들 종교에서 선과 악은 신의 뜻이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의된다.
- 다신교나 애니미즘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정령, 신, 악마, 유령 등 다른 지성을 가진 존재들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악행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영향이나 변덕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전체론이나 범신론적 세계관, 그리고 일부 다신교나 애니미즘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신 또는 신성한 우주의 일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생각은 서양 사상에서는 스토아 철학, 신플라톤주의, 스피노자의 철학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동양의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종교에서도 나타난다.
- 점성술에서는 인간의 개성이나 미래에 겪게 될 어려움 등이 행성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점성가들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운명을 예측하려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3. 2. 자유 의지와 결정론
자유 의지와 결정론 문제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의 중심을 차지해 왔다. 자유 의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킨다. 결정론은 인간에게 적용될 때, 내외적 압력에 의해 인간의 선택이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양립주의는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할 수 없으며, 즉 둘 다 동시에 옳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90]3. 3. 자연주의와 영성주의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어떤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연을 초월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인간을 완전히 육체적(물질) 존재로 보는 유물론과 물리주의를 포함한다. 다만, 일부 자연주의자는 심신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자연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계획된 존재가 아니며,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생겨났다. 이 관점에서는 초자연적인 사후 세계나 윤회를 믿지 않는다. 자연주의는 종종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각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여러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자연주의자들은 종종 종교적 신념을 근거 없는 사상, 주술적 사고, 미신 등과 유사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관념론(이데아론)은 유물론과 대조되는 입장이다. 이 관점은 본질적으로 현상과 진실을 구분하며,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는 숭고한 신성의 반영일 뿐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은 그 일부라고 본다. 플라톤은 이를 지하 동굴에 묶인 죄수에 비유하며, 보이는 것은 실재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플라톤에게 영혼은 몸을 사용하는 정신으로, 부자연스러운 결합 상태에 있으며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존재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은 유물론과 관념론의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이는 기독교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통합으로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을 동물적 측면(물질)과 이성적 측면(지성 있는 영혼)의 통합체로 보았다. 인간의 영혼은 영적이고 불멸하며 고유한 실체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에 의존하며 정신과 육체는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3. 4. 자연 상태
자연 상태란 사회적 요인이 더해지기 전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인간성의 "자연 본질"을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자연 상태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뉜다.'''성선설'''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 존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명령받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토마스 홉스와 견해를 같이했지만, 홉스와 달리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로 보았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자연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84]
-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원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스스로 선과 악을 완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악설'''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비관적으로 본다.
- 토마스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본질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쾌하고, 야만적이며, 짧다"고 묘사했다. 홉스는 강력한 정부만이 이러한 혼란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83]
- 기독교의 원죄 교리에 따르면,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본성이 타락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신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로 본다.
- 버트런드 러셀은 도덕적인 죄나 벌의 개념이, 포식자였던 인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장 자크 루소는 홉스와 로크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독자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원시 인간이 이성, 언어, 공동체 없이 고독하게 살았으며, 문명화 과정에서 불행해졌다고 보았다. 특히 루소는 원시 상태의 인간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는 "고귀한 야만인" 개념을 제시하며, 자연 상태를 문명 사회보다 긍정적으로 보기도 했다.[86]
한편, 생물학적 결정론과 환경 결정론은 인간의 행동이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자유 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오랜 논쟁과 연결된다.
3. 5. 도덕성
인간 도덕의 기원과 본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도덕적 실재론 또는 도덕적 객관주의: 도덕의 기준이 인간의 관점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본다. 인간의 의견과 관계없이 선과 악은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객관적인 도덕은 인간 본성이나 신의 명령, 혹은 둘 모두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의 기준을 사회 구성주의로 간주하며, 해당 사회 외부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 도덕 절대주의: 특정 행위가 맥락과 관계없이 선 또는 악으로 규정된다고 본다.
- 도덕적 보편주의: 도덕적 상대주의와 도덕 절대주의 사이의 절충적 입장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핵심적인 도덕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 비도덕주의: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3. 6. 인생의 의미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은 없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은 종종 세속적 인본주의를 따른다.반면, 목적론은 인간의 존재에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성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완전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5][20]
허무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존재도 객관적인 의미, 목적, 또는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4. 종교적 관점
종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다양한 종교 및 영적 전통은 인간의 기원, 본질,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설명을 제공한다.
아브라함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유일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신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한다. 선과 악은 신의 뜻이나 가르침에 순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의된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독교 신학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다신교나 애니미즘에서는 인간을 정령, 신, 악마, 유령과 같은 다른 지성을 가진 신화적 존재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악행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영향이나 변덕스러운 성질의 발현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전체론이나 범신론적 세계관, 그리고 불교나 힌두교와 같은 동아시아 종교 및 일부 서양 철학(스토아 철학, 신플라톤주의, 스피노자의 철학 등)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신성한 우주 또는 신의 일부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더 큰 전체와 연결된 존재로 여겨진다.
점성가들은 인간의 개성과 그가 마주하게 될 도전 과제들이 태어날 때의 행성 위치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려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4. 1. 기독교 신학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주요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영적이고, 성경적이며, 유신론적" 방식이며, 두 번째는 "자연적, 우주론적, 반신론적" 방식이다.[40] 이 글에서는 주로 전자의 관점을 다룬다.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 본성을 연구하며 "종교"가 "인간 본성"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고 보았다.[41]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모든 "성경적 인류학"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공통 주장이 존재한다.[42]
# 인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 인간은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 인간은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이 있다.
성경 자체가 단일하고 체계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교리"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43] 예를 들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인간 본성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44]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장에서 하느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행복을 향한 소명, 자유, 인간의 행위, 정념, 도덕적 양심, 덕, 그리고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45]
성경은 최초 창조 시 인간 본성이 "육신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 또는 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묘사한다. 이를 통해 "산 영혼", 즉 "살아있는 사람"이 창조되었다.[46] 창세기 1장 27절에 따르면, 이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47]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이다.[48]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찾아낸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별 짓는다.[49] 둘째,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고 다스리는 존재인 것처럼,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셋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48]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선하다"고 평가하신 것은 아담이 처음에는 "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50]
아담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능력과 함께 죄를 선택할 능력도 지니고 창조되었으며, 결국 죄를 선택함으로써 의로운 상태에서 "죄와 타락"의 상태로 떨어졌다.[48] 따라서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본다.[51]
아담의 죄로 인한 타락은 인간 본성을 "부패"시켰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느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죄는 보편적"이라고 가르친다.[48] 예를 들어, 시편 51편 5절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다.[52] 예수 역시 모든 사람이 "본래 죄인"이며, 죄가 인류의 "본성이자 성향"이라고 가르쳤다.[40]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의 본성"에 대해 언급한다.[53]
이처럼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48]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원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54] 원죄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죄를 짓는 경향성"을 의미한다.[55] 원죄 교리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대부분의 주요 개신교 교단에서 받아들여지지만, 유사한 개념인 조상 죄 교리를 가진 동방 정교회에서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원죄로 인한 부패는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 즉 이성, 의지뿐만 아니라 욕구와 충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태를 때때로 "전적 타락"이라고 부른다.[56] 그러나 전적 타락이 인류가 가능한 한 최대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57] 존 칼빈은 로마서 2장 14절을 주해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심어진 정의와 정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58]
아담은 "인간 본성 전체"를 대표했기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간 본성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된다.[59] 구약 성경이 "인간 본성의 부패"를 아담의 죄와 명시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지만, "죄의 보편성"은 아담과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죄의 보편성"을 인정하며, 구약이 암시했던 바, 즉 인류의 "죄의 본성"과 아담의 죄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힌다.[60] 로마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한 사람[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기록한다.[61] 바울은 또한 이러한 죄의 본성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내 죄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62][63]
인간 본성의 고유한 요소로서의 신학적 "원죄 교리"는 단순히 성경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로부터의 일반화"이기도 하다.[64]
20세기 초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본성을 "본질적으로 선하며", 단지 "적절한 훈련과 교육"만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경과 현실 경험은 인간 본성에 대한 "본질적으로 죄가 많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본성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 거듭나야" 한다.[72]
성경에 따르면, "아담의 불순종이 인간 본성을 부패시켰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게 인간을 "재생시키신다".[73] "재생은 근본적인 변화"이며 "우리 [인간] 본성의 갱신"을 포함한다.[74] 따라서 기독교는 원죄의 문제에 맞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완전한 변화"를 제시한다.[75]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타락한 인류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76] 신약성경은 재생의 "보편적인 필요성"을 강조한다.[77] 인간 본성의 재생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변화에 대한 성경적 묘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78]
:* 자신의 "옛 자아"(또는 "옛 사람")를 벗고 "새 자아"(또는 "새 사람")를 입음 (골로새서 3:9–10)[79]
:*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어울리기 힘들며", "질투하고, 화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하며, 신실하고, 온유하고, 자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됨 (갈라디아서 5:20–23)[80]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됨 (빌립보서 2:4)[81]
5. 과학적 이해
진화인류학과 인간 뇌의 진화 연구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 자연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서 인간 본성은 특별하고 정교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신의 개입이나 이데아와 같은 초월적 개념과 연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정불변의 인간 본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다윈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본성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현대 과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점이다.
다윈 이전에도 루소는 인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19세기 중반 이후, 고정된 인간 본성 개념은 헤겔, 마르크스, 니체, 사르트르와 같은 사상가들과 사회 구성주의자,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다. 과학적 관점 내에서도 행동주의, 결정론, 정신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이론들이 인간성의 기원과 작동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며,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과 다양성을 보여줌으로써 고정된 본성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과학자들과 자연주의, 유물론, 합리주의를 따르는 철학자들은 인간을 전적으로 자연 현상의 일부로 본다. 즉, 인간은 진화와 같은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 행동에 적용될 보편적인 선악의 기준을 찾으려 하지만, 일부 자연주의자들은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에 붙여진 꼬리표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영적인 존재로 보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을 규정하는 아브라함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나, 인간을 정령, 신 등 다른 지적 존재와 동등하게 보며 악을 초자연적 영향이나 변덕으로 설명하는 다신교 및 애니미즘, 인간 본성을 신성한 우주의 일부로 여기는 전체론, 범신론, 불교, 힌두교, 스토아 철학, 스피노자 철학 등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다. 점성술처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천체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철학과 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핵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무엇이 인간의 본성을 결정하거나 제약하는가?
- 인간의 본성은 어느 정도까지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가?
- 인간 본성은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가?
인간의 행동은 매우 다양하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변의 행동 양식을 찾기는 어렵다. 행동 과학 연구들은 인간성에 대한 작지만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생물학자들은 행동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찾고 있다. 유전자의 발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100%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여겨지지만, 유전적 영향이 강한 행동 특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E. O. 윌슨은 1979년 저서에서 인간 역시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이 명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에 인간 본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 분야가 협력하여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윌슨에 따르면, 문화 현상이나 의식 자체는 인간 본성이 아니지만, 예술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마음의 능력이나 뱀에 대한 혐오감, 근친상간 금지와 같은 보편적인 심리적 경향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이는 과학적 환원주의 방법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5. 1. 현대 철학
홉스는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기계처럼 운동하는 물질로 설명했다. 그는 과학과 인공물이 없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삶이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쾌하고, 야만적이고 짧을" 것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83] 홉스의 뒤를 이어 존 로크의 경험론 철학은 인간 본성을 '타불라 라사' (Tabula rasa), 즉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상태로 보았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선천적인 규칙 없이 태어나며, 감각적 경험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처리하는 규칙이 형성된다.[84]장 자크 루소는 홉스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더 극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프랑스 혁명 이전, 그리고 다윈이나 프로이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인물로, 흄과 동시대인이자 지인이었다. 루소는 그의 두 번째 담론에서 인간이 원래 이성이나 언어, 공동체 없이 고독하게 살았던 동물이며, 선사 시대의 우연한 계기로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여 당시 서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인간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즉, 인간은 현재 정치적이고 합리적이며 언어를 사용하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85] 이는 이성을 사용하는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으며, 어쩌면 이상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루소는 또한 원시적인 인간조차 본질적으로 사회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홉스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는 문명화된 인간이 문명과 인간 본성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인간이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이라는 '고귀한 야만인'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86] 루소의 이러한 사상은 이후 19세기와 20세기의 여러 지적, 정치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87] 칸트, 헤겔, 마르크스와 같은 철학자들과 독일 관념론, 역사주의, 낭만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루소와 다른 근대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을 언어, 추론, 그리고 더 복잡한 공동체를 발전시키도록 이끄는 동물적인 열정으로 이해했다. 반면, 데이비드 흄은 홉스나 루소처럼 인간 본성을 이기심과 같은 단일한 원리로 설명하려는 단순화된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허치슨과 샤프츠베리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흄은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한 이기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사회가 유지되지 않으면 파괴될 수 있는 더 사회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어떤 정치인이 '명예로운', '수치스러운', '사랑스러운', '혐오스러운', '고귀한', '비열한'과 같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며, 이는 인간에게 어떤 선천적인 "마음의 원래 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88] 흄은 또한 인간이 왜 타인에 대한 동정심, 즉 인간성을 가지는지 묻는 것은 지나친 탐구이며, 우리가 그것을 인간 본성의 힘으로 경험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왜 우리는 인간성, 즉 다른 사람들과의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기 위해 조사를 너무 멀리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 본성의 힘으로 경험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원인에 대한 우리의 조사는 어딘가에서 멈춰야 한다.[88]
흄의 이러한 경험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접근 방식은 당시 무신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이후 앵글로색슨 국가, 특히 미국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89]
마르크스는 종종 인간 본성을 부정하고 인간이 전적으로 사회화와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인간 본성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보았으며, 자본주의 이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개성과 본성을 더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대 철학, 특히 과학 철학의 한 분야인 생물학 철학에서는 인간 본성 개념이 여전히 활발한 논쟁의 대상이다.[1][2][3] 데이비드 L. 헐,[91] 마이클 기슬린,[92] 데이비드 불러[93] 등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대 진화 생물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헐은 특히 인간 본성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고유하며, 생물학적 종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를 정의하는 내재적 특성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했다. 그는 진화의 결과로서 변이는 모든 종의 본질적인 특징이며, 특정 시점에 한 종을 특징짓는 속성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이며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주장했다.[91]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91]
>생물학적 종은 때때로 해당 종에 속하는 유기체에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제한되는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은 일시적이고 우연적이며 상대적으로 드물다.
헐은 모든 종 구성원이 공유하는 속성은 다른 종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특정 종만이 가진 속성은 그 종의 모든 구성원이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추론한다. 따라서 그는 ''호모 사피엔스''를 정의하는 고정된 내재적 속성은 존재할 수 없으며, 종의 구성원 자격은 공유된 속성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예: 계보, 상호 교배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헐은 이러한 주장이 모든 인간이 동일한 본성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기반한 인권 개념의 생물학적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이것이 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91]
이러한 비판에 맞서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옹호한다. 그들은 인간 본성 개념이 신경과학이나 진화생물학 연구에서 여전히 유용하며,[1][2][3][98][95][100] 비본질주의적 관점이나 관계적 관점(상호 교배, 생태학적 지위, 계통 발생학적 관계 등)을 통해 현대 생물학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94]
에두아르 마셰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며 논쟁을 명료화하고자 했다.[95]
- '''본질주의적 인간 본성''': 인간이 되기 위해 개별적으로 필요하고 집합적으로 충분한 속성들의 집합. 이는 인간에게 내재적이고 고유한 본질로 간주된다.
- '''법칙론적 인간 본성''': 인간 종의 진화의 결과로 인간이 가지는 경향이 있는 속성들의 집합.
마셰리는 본질주의적 인간 본성 개념이 현대 진화 생물학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데 동의하지만, 법칙론적 개념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법칙론적 의미의 인간 본성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거나 고유할 필요는 없으며, 진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들(예: 이족 보행, 언어 능력, 자녀 양육 경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속성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 과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96] 마셰리는 이 법칙론적 개념이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도 인류 보편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97]
리처드 사무엘스는 '인과적 본질주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인간 본성을 "인간과 확실하게 연관된 피상적인 속성 및 규칙성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일련의 메커니즘, 과정 및 구조"로 정의한다.[100]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특성(예: '물이 젖다'는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특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인과적 메커니즘(예: '젖음'이라는 개념을 물에 적용하게 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사무엘스는 이 관점이 인간 본성의 설명적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진화 생물학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랜트 램지는 '생애사 특성 클러스터'라는 대안적 설명을 제안한다.[98] 그는 개인의 삶이 유전과 환경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수많은 가능한 '생애사'(삶의 경로)가 존재한다고 본다. 램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자신의 개념을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생애사 내의 특성 클러스터 패턴"을 참조하여 정의한다.[98] 즉, 부유하게 되는 것, 박사 과정 학생이 되는 것, 또는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삶이 취할 수 있는 특정 생애사, 즉 가능한 경로가 존재한다. 램지는 이러한 생애사의 원인을 파고듦으로써 이러한 가능한 경로 뒤에 숨겨진 패턴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기진맥진하면 땀을 흘린다"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거나, "인간은 도피-투쟁 모드에 있을 때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와 같은 신경학적 주장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램지가 피상적인 외관을 넘어 더 깊은 수준에서 개인 간의 유사점/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그 아래에 놓인 인과적 메커니즘(과정, 구조, 제약 등)을 가리킨다. 일단 개인의 모든 가능한 생애사를 나열하면, 이러한 인과적 패턴을 찾아 함께 더하여 개인의 본질을 형성하는 기초를 만들 수 있다.
램지의 다음 논증적 기동은 특성이 잠재적인 생애사 전반에 걸쳐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고 패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패턴은 개인 및 인간 본성의 개념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98] 한 개인의 '개인적 본질'은 해당 개인의 가능한 생애사 집합에 분포된 특성 클러스터의 패턴으로 구성되는 반면, 램지는 인간 본성을 "존재하는 인간 가능한 모든 생애사 내의 특성 클러스터 패턴"으로 정의한다.[98]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개인의 모든 가능한 생애사를 결합하면 인간 본성을 구성하는 특성 분포 패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램지의 설명에 따르면, 특성 패턴은 "여성이면 난소가 발달한다" 또는 "남성이면 고환이 발달한다"와 같은 조건문 형태로 포착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모든 인간에게 사실이 아닐 것이다. 램지는 이러한 진술이 좋은 균형을 이룬다면 인간 본성의 일부를 포착한다고 주장한다. 즉, ''보편성''(많은 사람들이 조건문의 전건을 충족함)과 ''견고성''(전건을 충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후건을 충족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은 현대 철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이며,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 생물학 및 다른 과학 분야와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대안적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
5. 2. 본능적 행동
본능적 행동, 즉 특정 복잡한 행동에 대한 내재된 경향은 인간에게서도 관찰된다. 공포와 같은 감정은 인간 본성의 일부로 여겨지지만(공포 § 선천적 공포 참조), 동시에 고정되지 않고 가변적인 특성도 지니는데, 이는 신경가소성 개념이나 일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사례(공포 § 공포를 경험할 수 없음)를 통해 알 수 있다.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뱀과 거미에 대한 선천적인 공포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에게서도 발견되었다.[101]
- 아기의 울음은 본능의 한 표현이다. 아기는 오랜 성장 기간 동안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울음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
- 모성 본능, 특히 아기의 울음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본능은 오랫동안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 메커니즘은 어머니의 뇌를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fMRI)으로 관찰하여 일부 해명되었다.[102]
- 무리 본능은 인간의 아이들과 침팬지 새끼에게서는 나타나지만, 어린 오랑우탄에게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103]
- 인간의 비위생적임과 혐오감은 진화 과정에서 신체를 보호하고 다양한 질병에 의한 감염을 피하기 위해 발달된 본능이다.[104]
5. 3. 사회경제적 맥락
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인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이다.[105] 일부에서는 ''H. 사피엔스''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속 불가능성은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속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106] 반면, 인간 본성이 반드시 지속 불가능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107] 이는 현대 사회경제적 거시 시스템이 인간의 활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108] 1997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인류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본성과 "조직화된 사회의 구축된 환경" 사이의 "부적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결론지었다.[109] 유한한 지구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화적 서사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오래된 타고난 경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106]루소는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인간이 본래 고독한 존재였으며 정치와 사회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 사상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인간이 현재 정치적이고 합리적이며 언어를 사용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았다. 루소는 인간 본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불합리하고 도덕 의식과는 거리가 먼 본능적 감정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는 종종 인간 본성을 부정하고 사회화와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타불라 라사로 간주했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보았으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개성과 본성을 더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 사상가들은 187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마르크스와는 상당히 다른 독자적인 관점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불변하는 인간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제한된 합리성과 한계 효용 추구와 같은 인간 본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제학과 비슷한 시기에 오스트리아에서는 프로이트에 의해 정신분석학이 태동했다. 프로이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인간의 경제 환경이 지적, 윤리적, 예술적 태도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에 주목한 점은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계급 투쟁 개념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계급 투쟁 외에도 아버지와 아들, 집단의 지도자와 도전자 사이의 근원적인 투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인간 본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110] 이러한 인간 본성은 인간 활동의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현대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집단 의사 결정 메커니즘은 인간 본성이 발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 웰빙, 존경, 지위 추구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으로 여겨지는 것들[111]은 다양한 제품 디자인, 직업의 종류, 공공 기반 시설의 설계, 그리고 재화의 분배 방식 등에 영향을 준다.
천성 대 양육 논쟁과 유사하게, 인간 행동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논의처럼, 인간 본성이 시스템적 구조에 의해 얼마나 형성되고 관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어느 정도까지 의도적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5. 4. 진화 심리학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심리적 특성들이 자연 선택을 포함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는 학문 분야이다.[1][2][3] 이는 인간의 마음이 특정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설계된 정보 처리 장치들의 집합이라고 본다.진화 심리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E. O. 윌슨은 인간 역시 자연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모든 과학적 탐구는 이 명제를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79년 저서에서 "인간 또한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는 명제는... 이 견해를 회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 인간의 처한 상황을 진지하게 고찰하고자 할 때, 이 명제는 항상 그 출발점에 놓여야 할 필수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100] 그는 1998년에는 인간 본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 분야가 협력하여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윌슨에 따르면, 미술과 같은 문화적 현상이나 의식 자체는 인간 본성이 아니지만, 예술을 창작하고 감상하는 마음의 능력이나 뱀에 대한 혐오감, 근친상간 금지와 같은 보편적인 심리적 경향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이는 과학적 환원주의 방법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존 로크가 주장한 타불라 라사(Tabula rasa), 즉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상태와 같다는 경험론적 견해와는 대립한다. 로크의 관점에서 마음의 규칙은 오직 감각 경험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특정 정보를 더 쉽게 학습하고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선천적인 심리적 기제들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하며, 이는 E.O. 윌슨의 사회생물학과 함께 타불라 라사 개념을 강하게 비판하는 근거가 되었다.
인간에게는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 및 심리적 특성들이 존재한다. 인류학자 도널드 E. 브라운은 그의 저서 『휴먼 유니버설즈』(Human Universals)에서 모든 인간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약 400가지의 기본적이고 불변하는 특징들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은 유사한 표정 문법을 공유하며, 웃음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눈을 이용한 의사소통 역시 보편적이다. 얼굴의 매력도 판단에 있어 좌우 대칭성과 평균적인 특징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건강함과 우수한 유전적 자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진다.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평가할 때 특정 특징(예: 늠름함, 적극성)을 선호하는 경향이나, 배란기에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현상도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신생아는 다른 형태보다 인간의 얼굴을, 다른 소리보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선호하는 강한 선천적 경향을 보인다.
인간에게는 복잡한 행동을 유발하는 본능적인 경향들도 관찰된다.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 반응(예: 뱀, 거미)은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서도 나타나며, 이는 생존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도록 진화된 결과일 수 있다.[101] 아기의 울음이나 이에 반응하는 모성 본능 역시 생존에 필수적인 본능적 행동으로 여겨진다.[102] 인간 아이들과 침팬지 새끼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무리 본능은 사회적 유대 형성에 기여하는 본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103] 또한, 불결하거나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혐오감은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진화된 중요한 방어 기제로 설명된다.[104] 이러한 본능적 경향들은 유전적 기반을 가지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므로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신경가소성 참조).
진화인류학과 인간 뇌의 진화 연구는 이러한 진화 심리학적 접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간 본성의 생물학적 기반을 탐구한다.
6. 한국의 관점
주어진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 있어 해당 섹션의 내용을 작성하고 검토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검토하려면 원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조
[1]
서적
Why We Disagree About Human Nature
2018-07-19
[2]
간행물
Recent Work on Human Nature: Beyond Traditional Essences
https://pub.uni-biel[...]
2014-09
[3]
서적
Arguing About Human Nature: Contemporary Debates
Routledge
[4]
간행물
What neurological syndromes can tell us about human nature: some lessons from phantom limbs, capgras syndrome, and anosognosia
1996
[5]
간행물
Review of Jean-Pierre Changeux and Paul Ricoeur. 2000. What Makes Us Think? A Neuroscientist and Philosopher Argue about Ethics, Human Nature, and the Brain
2002
[6]
간행물
Biology, politics, and the emerging science of human nature
2008-11-07
[7]
간행물
The moral animal: virtue, vice, and human nature
2016
[8]
문서
Progress or Return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9]
문서
Metaphysics
https://www.perseus.[...]
[10]
웹사이트
Western Philosophical Schools and Doctrines: Ancient and Medieval Schools: Sophists: Particular Doctrines: Theoretical issues
https://web.archive.[...]
1995
[11]
학위논문
Teleological Realism in Biology
https://curate.nd.ed[...]
University Of Notre Dame
[12]
웹사이트
Darwin and His Theory of Evolution
https://www.pewresea[...]
2009-02-04
[13]
문서
Aristotle's Metaphysics
[14]
문서
Nicomachean Ethics
[15]
문서
Nicomachean Ethics
https://www.perseus.[...]
[16]
문서
Nicomachean Ethics
https://www.perseus.[...]
[17]
문서
Politics
https://www.perseus.[...]
[18]
문서
Poetics
https://www.perseus.[...]
[19]
서적
The Politics of Aristotle: With an Introduction, Two Prefatory Essays and Notes Critical and Explanatory
https://books.google[...]
Clarendon Press
[20]
문서
Nicomachean Ethics
[21]
문서
Human Nature in Chinese Thought: A Wittgensteinian Treatment
International Wittgenstein Symposium
[22]
서적
Education as Cultivation in Chinese Culture
Springer
[23]
웹사이트
Xunzi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8
[24]
문서
Mencius
[25]
웹사이트
Mencius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4-12-03
[26]
웹사이트
Chinese Ethics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8-09-14
[27]
웹사이트
Mencius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4-12-03
[27]
웹사이트
Chinese Ethics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8-09-14
[28]
간행물
Rational Choice Analysis In Classical Chinese Political Thought: The "Han Feizi"
2008-01
[29]
웹사이트
Xunzi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8-07-06
[30]
간행물
Rational Choice Analysis In Classical Chinese Political Thought: The "Han Feizi"
2008-01
[31]
문서
Xunzi
[32]
서적
The Ambivalence of Creation: Debates Concerning Innovation and Artifice in Early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33]
간행물
Human Nature and Moral Understanding in Xunzi
1994
[34]
서적
Education as cultivation in Chinese culture
2014
[35]
서적
World History, Volume I: To 1800
Wadsworth Cengage
2008-12-26
[36]
서적
China's legalists: The earliest totalitarians and their art of ruling
M.E. Sharpe
1996
[37]
웹사이트
Legalism in Chinese Philosophy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8-11-16
[38]
간행물
Han Fei Zi's Philosophical Psychology: Human Nature, Scarcity, and the Neo-Darwinian Consensus
2011-06
[39]
서적
Manetti, Giannozzo
https://www.oxfordre[...]
Oxford University Press
2023-10-10
[40]
서적
Christian Doctrine of Sin
Scribner
1876
[41]
서적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Modern Library
1902
[42]
서적
Anthropolog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43]
서적
Human Being, Doctrine of
Baker Publishing Group
2005
[44]
웹사이트
Anthropology and Human Nature, 13
https://www.udel.edu[...]
[45]
웹사이트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 IntraText
https://www.vatican.[...]
[46]
서적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96
[47]
웹사이트
Genesis Chapter 1 (NIV)
http://www.bluelette[...]
[48]
서적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1986
[49]
서적
Image of God
Baker Publishing Group
2005
[50]
서적
A Dictionary of the Holy Bible
Griffin and Rudd
1813
[51]
서적
Human Nature: Reflections on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Templeton Press
2006
[52]
Bible
Psalm 51:5
[53]
웹사이트
Romans 7:18. – Bible Gateway
https://www.biblegat[...]
[54]
문서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aker
2005
[55]
문서
original si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56]
문서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1986
[57]
문서
Systematic Theology
Eerdmans
1996
[58]
서적
Commentary on Romans
[59]
문서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1986
[60]
문서
A Dictionary of the Bible: Pleroma-Zuzim
C. Scribner's Sons
1902
[61]
웹사이트
Bible Gateway passage: Romans 5:19 – GOD'S WORD Translation
https://www.biblegat[...]
[62]
웹사이트
Romans 7:18 – NIRV – I know there is nothing good in my sinful natur...
http://www.biblestud[...]
[63]
웹사이트
Sarx – New Testament Greek Lexicon – New American Standard
http://www.biblestud[...]
[64]
서적
Christian Doctrine of Sin
Scribner, Armstrong
1876
[65]
서적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66]
웹사이트
Dr. Burton White, 84, believed children should avoid day care – The Boston Globe
https://www.bostongl[...]
[67]
서적
Raising a Happy, Unspoiled Child
Touchstone
1995
[68]
서적
The Challenge of Facts and Other Essays
https://archive.org/[...]
Yale University
[69]
서적
What Social Classes Owe to Each Other
https://archive.org/[...]
Harper & Brothers
[70]
서적
I'm OK — You're OK
HarperCollins
2004
[71]
서적
Unto Others: The Evolution and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72]
서적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73]
서적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Baker
[74]
서적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75]
서적
Dictionary for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Baker
[76]
서적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77]
서적
Mercer Dictionary of the Bible
Mercer University
[78]
웹사이트
Bible Gateway passage: Romans 12:2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https://www.biblegat[...]
[79]
웹사이트
Colossians Chapter 3 (NIV)
http://www.bluelette[...]
[80]
웹사이트
Bible Gateway passage: Galatians 5:20–23 –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https://www.biblegat[...]
[81]
웹사이트
Bible Gateway passage: Philippians 2:4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https://www.biblegat[...]
[82]
웹사이트
Francis Bacon: Novum Organum (1620)
http://www.constitut[...]
2016-02-23
[83]
서적
Leviathan
[84]
서적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Hackett Publishing Company
[85]
서적
The Social Contract
Penguin Classics
[86]
서적
Being after Rousseau: Philosophy and Culture in Ques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87]
서적
Rousseau and the Ethics of Virtu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88]
문서
An Enquiry into the Sources of Morals
http://www.earlymode[...]
[89]
웹사이트
Hume, David {{!}}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iep.utm.edu/[...]
2024-10-03
[90]
서적
Conversations on human nature
Routledge
[91]
논문
On Human Nature
1986-01
[92]
서적
Metaphysics and the origins of speci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93]
서적
Adapting minds
MIT Press
[94]
논문
Darwinian Metaphysics: Species and the Question of Essentialism
2002
[95]
논문
A Plea for Human Nature
2008-06
[96]
서적
Doubling Down on the Nomological Notion of Human Nature
http://www.oxfordsch[...]
Oxford University Press
2018-07-19
[97]
서적
Conversations on human nature
Routledge
[98]
논문
Human Nature in a Post-essentialist World
https://www.research[...]
2019-01-21
[99]
서적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100]
논문
Science and Human Nature
https://philpapers.o[...]
2012
[101]
논문
Itsy Bitsy Spider…: Infants React with Increased Arousal to Spiders and Snakes
[102]
논문
Neurobiology of culturally common maternal responses to infant cry
[103]
논문
Majority-Biased Transmission in Chimpanzees and Human Children, but Not Orangutans
[104]
논문
Disgust as an adaptive system for disease avoidance behaviour
[105]
논문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brain: mechanistic insights from human and animal research
2010-09
[106]
논문
What's blocking sustainability? Human nature, cognition, and denial
2010-10-01
[107]
뉴스
Human Nature and Capitalism {{!}} AEI
https://www.aei.org/[...]
2021-04-16
[108]
논문
Macrosystems as metacoupled human and natural systems
2021
[109]
논문
Evolutionary Psychology: Toward a New View of Human Nature and Organizational Society
https://link.springe[...]
2021-04-16
[110]
논문
Human Nature and Enhancement
2009
[111]
논문
Is the desire for status a fundamental human motiv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2015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