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즈야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지즈야는 이슬람 국가에서 비무슬림에게 부과되던 세금으로, 다양한 어원과 의미를 가진다. 초기에는 '보호의 대가' 또는 '군 복무 면제'의 의미로 부과되었으며, 징수 방법과 세율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다. 꾸란에는 지즈야 부과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며, 고전 시대에는 대상과 면제 조건이 존재했다. 역사적으로 지즈야는 인도, 오스만 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 강제로 징수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현대에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지즈야가 부과되지 않으며, 굴욕적인 징수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딤미 제도가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은 짐미에게서 징수된 연공이나 조세를 통칭하는 말이었다. 그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한 것이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즈야는 짐미에게서 징수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토지세로 구분되었다. 즉, 이슬람 정권이 "짐마의 백성(ahl al-Dhimma)=짐미"에게 "보호(짐마)의 부과"로서 조세라는 성격이 명확해졌다.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는 짐미에게서 징수하던 연공 또는 조세를 의미한다. 지역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한 것이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즈야는 짐미에게서 징수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 및 토지세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는 이슬람 정권이 "짐마의 백성(ahl al-Dhimma)=짐미"에게 "보호(짐마)의 부과"로서 조세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이다.
2. 어원 및 의미
8세기 중반 아바스 혁명으로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면서 비아랍인에 대한 조세 차별 대우가 철폐되었다. 무슬림은 비아랍인이라도 지즈야가 부과되지 않았고,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면 하라지(토지세)가 부과되었다. 이로써 지즈야는 주로 비무슬림에게 적용되었지만, 16세기 이후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1564년 힌두교도의 회유를 위해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그러나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짐미(보호민)로서 생명·재산·종교적 자유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장받았다. 지즈야는 본래 성서를 따르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즉 경전의 백성에게 적용되었으나,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비무슬림에게 적용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비무슬림에게 가혹한 부담이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였기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과 사회적 차별을 피하고자 많은 짐미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지즈야는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되면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해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꺼리는 풍조도 생겨났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에서는 외국인에게서 징수한 지즈야를 사회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비무슬림에게 지즈야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ISIL이 지배 지역 내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그 예이다.[198]
2. 1. 어원
"지즈야"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앤 램턴은 "지즈야"의 기원이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한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상으로, 다른 이들은 이슬람교도 땅에서 사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으로 간주한다.[24]
이란 백과사전에 따르면, 아랍어 단어 "지즈야"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사회 하류 계층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의미하는 중세 페르시아어 "가지타크"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당시 귀족, 성직자, 토지 소유자(데칸) 및 서기(또는 공무원, 다비란)는 이 세금이 면제되었다. 무슬림 아랍 정복자들은 정복한 사산 왕조와 비잔틴 제국의 과세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24]
M. H. 샤키르는 코란 영어 번역본에서 "지즈야"를 '세금'으로 번역했고, 마르마듀크 픽탈과 아서 존 아르베리는 "조공"으로 번역했다. 압둘라 유수프 알리는 이 용어를 "지즈야"로 음역하는 것을 선호했다. 유수프 알리는 "지즈야"의 근본적인 의미를 "보상"으로 간주했고,[25] 무함마드 아사드는 "만족"으로 간주했다.[25]
고전 이슬람교 사전 편찬자인 알-라기브 알-이스파하니(1108년 사망)는 "지즈야"가 "딤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들에게 보장된 보호의 대가로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기록했다.[26] 그는 이 단어의 파생어가 "코란"의 일부 구절에도 나타난다고 지적한다.[27]
무함마드 아브델-할림은 인두세라는 용어가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인두세와 달리, 어린이, 여성 등에게 면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아랍어 단어 "지즈야"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며 부정확하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지즈야"의 어근 동사는 j-z-y이며, 이는 '무언가에 대한 보상', '무언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다'를 의미하며, 무슬림 국가의 보호와 모든 이로 인한 혜택 및 군 복무 면제, 그리고 "자카트"와 같은 무슬림에 대한 세금의 대가라고 덧붙인다.
역사학자 알-타바리와 하디스 학자 알-바이하키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ʿ우마르 이븐 알-하타브에게 "지즈야"를 문자 그대로 '자선'을 의미하는 "사다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질문했고, 그는 허락했다고 전한다.[28][29] 이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샤피, 하나피, 한발리 학파의 대다수 법학자들은 "지즈야"를 "아흘 알-짐마"로부터 "자카트" 또는 "사다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이 합법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을 지즈야라고 부를 필요는 없으며, 또한 "목표와 의미에 고려가 부여되며, 용어와 특정 표현에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알려진 법적 격언에 근거한다고 말한다.[30]
레인의 사전에 따르면, "지즈야"는 이슬람 정부의 자유 비무슬림 국민들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으로, 그들이 보호를 보장하는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라고 한다.[31][32]
마이클 G. 모로니에 따르면 보호 지위의 등장과 비무슬림 국민에 대한 인두세로서 "지즈야"의 정의는 8세기 초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차 내전 중 비무슬림 인구의 충성심에 대한 커져가는 의심과 경건한 무슬림들의 코란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의 결과로 나타났다.[33]
제인 담멘 맥어리프는 이슬람 초기의 텍스트에서 "지즈야"는 비무슬림에게서 기대되는 연간 조공이었지 인두세가 아니었다고 말한다.[34] 마찬가지로, 토마스 워커 아놀드는 "지즈야"가 원래 아랍 제국의 비무슬림 국민들이 지불한 모든 유형의 조공을 의미했지만, 나중에 "새로운 통치자들의 재정 시스템이 고정되면서" 인두세에 사용되었다고 썼다.[35]
아서 스탠리 트리톤은 서부의 "지즈야"와 아라비아 동부의 "하라즈" 모두 '조공'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예루살렘에서는 "자왈리"라고도 불렸다. 셰메시는 아부 유수프, 아부 우바이드 이븐 알-살람, 쿠다마 이븐 자파르, 하티브, 야흐야 이븐 아담이 "지즈야", "하라즈", "우쉬르" 및 "타스크"라는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했다고 말한다.[36]
아랍어 사전 편찬자 에드워드 윌리엄 레인은 "지즈야"라는 용어의 어원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슬림 정부의 자유 비무슬림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으로, 마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그들이 보호를 보장하는 조약을 비준한다."[37]
2. 2. 의미
"지즈야"라는 단어의 정의와 어원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앤 램턴은 "지즈야"의 기원이 매우 복잡하며, 일부 법학자들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으로, 다른 이들은 "무슬림 땅에서 사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상"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한다.
이란 백과사전에 따르면, 아랍어 단어 "지즈야"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사회 하류 계층에게 부과된 세금을 의미하는 중세 페르시아어 "가지타크"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세금은 귀족, 성직자, 토지 소유자(데칸) 및 서기(또는 공무원, 다비란)는 면제되었다.[24]
샤키르는 코란 영어 번역본에서 "지즈야"를 '세금'으로 번역했고, 픽탈과 아르베리는 "조공"으로 번역했다. 유수프 알리는 이 용어를 "지즈야"로 음역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지즈야"의 근본적인 의미를 "보상"으로 간주했다.[25] 무함마드 아사드는 "만족"으로 간주했다.[25]
고전 무슬림 사전 편찬자인 알-라기브 알-이스파하니 (1108년 사망)는 "지즈야"가 "짐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들에게 보장된 보호의 대가로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썼다.[26]
무함마드 아브델-할림은 인두세라는 용어가 어린이, 여성 등에게 면제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아랍어 단어 "지즈야"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며 부정확하다고 말한다. 그는 "지즈야"의 어근 동사는 j-z-y이며, 이는 '무언가에 대한 보상', '무언가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다'를 의미하며, 무슬림 국가의 보호와 모든 이로 인한 혜택 및 군 복무 면제, 그리고 "자카트"와 같은 무슬림에 대한 세금의 대가라고 덧붙인다.
역사학자 알-타바리와 하디스 학자 알-바이하키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ʿ우마르 이븐 알-하타브에게 "지즈야"를 문자 그대로 '자선'을 의미하는 "사다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질문했고, 그는 허락했다고 전한다.[28][29]
레인의 사전에 따르면, "지즈야"는 이슬람 정부의 자유 비무슬림 국민들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으로, 그들이 보호를 보장하는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라고 한다.[31][32]
마이클 G. 모로니는 [보호 지위의 등장]과 비무슬림 국민에 대한 인두세로서 "지즈야"의 정의는 8세기 초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33]
제인 담멘 맥어리프는 이슬람 초기의 텍스트에서 "지즈야"는 비무슬림에게서 기대되는 연간 조공이었지 인두세가 아니었다고 말한다.[34] 토마스 워커 아놀드는 "지즈야"가 원래 아랍 제국의 비무슬림 국민들이 지불한 모든 유형의 조공을 의미했지만, 나중에 인두세에 사용되었다고 썼다.[35]
아서 스탠리 트리톤은 서부의 "지즈야"와 아라비아 동부의 "하라즈" 모두 '조공'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아랍어 사전 편찬자 에드워드 윌리엄 레인은 "지즈야"라는 용어의 어원을 분석한 후, "무슬림 정부의 자유 비무슬림 국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으로, 마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그들이 보호를 보장하는 조약을 비준한다."라고 설명한다.[37]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은 짐미로부터 징수된 연공이나 조세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한 것이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자가 증가하면서, 지즈야는 짐미로부터 징수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토지세로 하는 용어상의 구별이 정착하게 되었다.
8세기 중반 아바스 혁명 이후, 무슬림이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는 부과되지 않았고,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라지(토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단,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짐미(보호민)로서 생명·재산·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얻었다. 지즈야는 본래 경전의 백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외의 비무슬림에게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 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하위에 위치한 비무슬림에게는 가혹한 부담이 되었고, 또한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지즈야에 의한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된 점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는 풍조도 생겼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비무슬림에 대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에 ISIL이 지배 지역 내의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198]
3. 명분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근처에 사는 페르시아인 개종자 등이 이슬람 초기부터 무슬림이었음에도 아랍인 무슬림과 세금 부담에 차별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8대 칼리파 우마르 2세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짐미의 이슬람 개종을 장려하기 위해 짐미와 마왈리(비 아랍인 개종자) 간 조세 부담 차이를 없애고, 마왈리에게서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려 했다. 그는 호라산 총독에게 "메카 방향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모두 지즈야를 면제하라"고 명령했다.[194] 이 명령으로 집단 개종이 일어나 세수가 줄자, 총독은 세금 회피를 위한 개종을 막기 위해 할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우마르 2세는 "신은 할례를 위해 무함마드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194]
8세기 중반 아바스 혁명으로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면서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 차별이 철폐되었다. 무슬림은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를 내지 않았고, 아랍인은 토지를 소유하면 하라지(토지세)를 내게 되었다.
이후 지즈야는 주로 비무슬림에게 부과되었지만, 16세기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의 3대 황제 악바르는 힌두교도 회유를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그러나 6대 아우랑제브는 다시 비무슬림에게 지즈야를 부과했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짐미(보호민)로서 생명, 재산,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았다. 지즈야는 원래 성서를 따르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즉 경전의 백성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슬람 세계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비무슬림에게 적용되었다.[195]
지즈야는 무슬림보다 하위에 있던 비무슬림에게 가혹한 부담이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였기에[196] 굴욕으로 여겨졌다. 많은 짐미들이 금전적 부담과 차별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뭄바이로 도망간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은 인도에서 페르시아인을 의미하는 "파르시"로 불렸다.
지즈야는 비무슬림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주요 재원이었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우려해 개종을 꺼리는 풍조도 생겼다. 이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콩키스타가 성공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레콩키스타 이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된 유대교도를 오스만 제국이 "지즈야를 납부하는 백성"으로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는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서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처럼 사회 복지 재원으로 사용한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국가 수립 후 비무슬림에게 지즈야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가 된다.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지배한 ISIL이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것은 복고적 이슬람 지배를 목표로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198]
지즈야에 대한 다양한 명분은 다음과 같다.3. 1. 보호의 대가
아부 알-파들(Abou Al-Fadl)과 다른 학자들에 따르면, 고전 이슬람 법학자들과 학자들은 지즈야를 무슬림이 모든 유형의 침략에 대해 수행하는 보호의 책임에 대한 대가로 특정 비무슬림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한 지불로 간주한다.[6][5][32][38][39][40][41] 이는 비무슬림이 군 복무를 면제받는 대가이자,[6][5][42][43][44] 가난한 딤미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대가로 간주된다.[18]
할리드가 히라 인근의 일부 마을과 맺은 조약에서 "만약 우리가 당신을 보호한다면, 지즈야를 우리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다.[45][46][47][48][49]
초기 하나피 법학자 아부 유수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 아부 우바이다가 시리아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지즈야와 농지세(''하라지'')를 징수한 후, 로마인이 그를 상대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이 그와 무슬림에게 매우 심각해졌다는 정보를 받았다. 아부 우바이다는 지즈야와 하라지에서 징수된 금액을 반환하고 피지배자들에게 "우리는 당신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가 우리를 상대로 일으켜지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약에서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당신에게서 받은 것을 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는 규정과 기록된 것을 준수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조약이 체결된 도시의 총독에게 편지를 썼다.[50][51][52]
이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국고에서 반환되었고,[50]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의 머리에 축복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를 다스리고 로마인에게 승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에게 남은 모든 것을 가져갔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50][51]
마찬가지로, 십자군 시대에 살라딘은 시리아에서 철수해야 했을 때 시리아의 기독교인에게 지즈야를 반환했다.[53] 안티오크 인근의 기독교 부족인 알-주라이마는 무슬림과 평화를 맺고, 그들의 동맹이 되어 전투에서 그들의 편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즈야를 지불하지 않고 전리품의 적절한 몫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다.[54][55]
동양학자 토마스 워커 아놀드는 무슬림도 비무슬림처럼 군 복무에서 면제될 경우 세금을 내야 했다고 썼다.[56][57] 샤피 학자 알-카티브 아쉬-시르비니는 "군 복무는 비무슬림, 특히 딤미에게 의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지즈야를 지불하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58] 이븐 하자르 알-아스칼라니는 이슬람 법학자들 사이에 지즈야가 군 복무에 대한 대가라는 합의가 있다고 말한다.[59]
전쟁의 경우, 지즈야는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는 옵션으로 간주된다. 아불 칼람 아자드에 따르면, 지즈야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적대 행위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무슬림과 싸우는 비무슬림에게 지즈야 지불에 동의함으로써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즈야는 비무슬림과의 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종식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60] 마흐무드 샬투트는 "지즈야는 결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거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굴복을 의미하고, 적대 행위를 종식하며, 국가의 부담을 분담한다는 상징으로 의도되었다."라고 설명한다.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은 짐미로부터 징수된 연공이나 조세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의 개종자가 증가하면서, 지즈야는 짐미로부터 징수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토지세로 하는 용어상의 구별이 정착하게 되었다. 즉, 이슬람 정권이 "짐마의 백성(ahl al-Dhimma)=짐미"에 대해 내리는 "보호(짐마)의 부과"로서 조세라는 성격이 명확해졌다.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근처에 사는 개종 페르시아인 등은 이슬람 대정복 시대 초기에 무슬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 무슬림과의 사이에 세금 부담의 불평등이 있는 것에 큰 불만을 품었다. 동 왕조 제8대 칼리파 우마르 2세는 이러한 불만을 간파하고, 짐미 (이교도)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장려하려 하여, 짐미와 마왈리 (비 아랍인 개종자)의 조세 부담에 차이를 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마왈리로부터의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려 했다. 호라산 총독 자라에게 "메카 방향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모두 지즈야를 면제하라"고 명령한 것이 그 증거이다. 그 명령으로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나 세수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자라는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종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그 증거로서 할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마르 2세는 "신은 할례를 위해 무함마드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194]
8세기 중반의 아바스 혁명에 의해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어, 그전까지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상의 차별 대우가 철폐되었다. 무슬림이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는 부과되지 않았고, 그 대신 "아랍의 특권"은 배제되어,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라지 (토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이슬람 왕조로서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회유를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단,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짐미(보호민)로서 일정한 생명·재산·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얻었다. 지즈야는 본래 성서를 받드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이른바 경전의 백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외의 비무슬림에게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 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하위에 위치한 비무슬림에게는 가혹한 부담이 되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과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많은 짐미가 다른 지역으로의 도망이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선택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한 예로는, 뭄바이 방면으로 도망간 구 사산 왕조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가 있으며, 그들은 인도에서는 페르시아인의 의미로 "파르시"라고 불리고 있다.
지즈야에 의한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된 점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는 풍조도 생겨, 이슬람 정권 하의 많은 국민이 비무슬림으로 남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이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레콩키스타 성공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레콩키스타가 끝난 후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유대교도가 국외로 추방되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그들을 "지즈야를 납부해주는 백성"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인 예 등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고 있는 현대의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대상 외의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제정일치의 국가를 수립한 후에는 비무슬림에 대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에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실효 지배하는 과격 단체 ISIL이, 지배 지역 내의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복고적인 이슬람 지배를 목표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198]
3. 2. 기타 명분
현대 학자들은 역사적 맥락과 현대 이슬람 사상가들 사이에서 지즈야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해왔다.[61]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은 짐미로부터 징수된 연공이나 조세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의 개종자가 증가하면서, 지즈야는 짐미로부터 징수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토지세로 하는 용어상의 구별이 정착하게 되었다. 즉, 이슬람 정권이 "짐마의 백성(ahl al-Dhimma)=짐미"에 대해 내리는 "보호(짐마)의 부과"로서 조세라는 성격이 명확해졌다.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근처에 사는 개종 페르시아인 등이 이슬람 대정복 시대 초기에 무슬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 무슬림과의 사이에 세금 부담의 불평등이 있는 것에 큰 불만을 품었다. 동 왕조 제8대 칼리파 우마르 2세는 이러한 불만을 간파하고, 또한 짐미 (이교도)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장려하려 하여, 짐미와 마왈리 (비 아랍인 개종자)의 조세 부담에 차이를 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마왈리로부터의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려 했다. 호라산 총독 자라에게 "메카 방향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모두 지즈야를 면제하라"고 명령한 것이 그 증거이다. 그 명령으로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나 세수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자라는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종하고 있는 것뿐이므로, 그 증거로서 할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마르 2세는 "신은 할례를 위해 무함마드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194]
8세기 중반의 아바스 혁명에 의해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어, 그전까지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상의 차별 대우가 철폐되었다. 무슬림이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는 부과되지 않았고, 그 대신 "아랍의 특권"은 배제되어,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라지 (토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지즈야는 주로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 되었지만, 16세기 이후 이슬람 왕조로서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회유를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단,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짐미(보호민)로서 일정한 생명·재산·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얻었다. 지즈야는 본래 성서를 받드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이른바 경전의 백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외의 비무슬림에게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 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하위에 위치한 비무슬림에게는 가혹한 부담이 되었고, 또한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과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많은 짐미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슬람으로 개종을 선택하기도 했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한 예로는, 뭄바이 방면으로 도망간 구 사산 왕조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가 있으며, 그들은 인도에서는 페르시아인의 의미로 "파르시"라고 불리고 있다.
지즈야에 의한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된 점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는 풍조도 생겨, 이슬람 정권 하의 많은 국민이 비무슬림으로 남는 사례도 있었다. 이것이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레콩키스타 성공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레콩키스타가 끝난 후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유대교도가 국외로 추방되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그들을 "지즈야를 납부해주는 백성"으로 환영하여 받아들인 예 등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고 있는 현대의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대상 외의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제정일치의 국가를 수립한 후에는 비무슬림에 대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에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실효 지배하는 과격 단체 ISIL이, 지배 지역 내의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복고적인 이슬람 지배를 목표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198]
4. 코란(꾸란)의 근거
코란은 다음 구절을 통해 지즈야를 승인했다.
qātilū-lladhīna lā yuʾminūna bi-llāhi wa-lā bi-l-yawmi-l-ākhir, wa-lā yuḥarrimūna mā ḥarrama-llāhu wa-rasūluh, wa-lā yadīnūna dīna'l-ḥaqq, ḥattā yu'ṭū-l-jizyata 'an yadin, wa-hum ṣāghirūn|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금지한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책을 받은 자들 중에서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싸우되, 그들이 지즈야를 기꺼이 바치고 겸손해질 때까지.ar (번역은 ''The Study Quran''을 통해 이루어짐)
이 구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1.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qātilū-lladhīna lā yuʾminūna bi-llāhi wa-lā bi-l-yawmi-l-ākhir'')
무함마드 사'이드 라마단 알-부티는 이 구절이 ''qitāl'' (قتال|키탈ar)을 명령하는 것이지 ''qatl'' (قتل|카틀ar)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며,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qataltu'' (قتلت|카탈투ar)는 싸움을 시작했을 때 사용하는 반면, ''qātaltu'' (قاتلت|카탈투ar)는 상대방의 공격에 저항하거나 선제공격하여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함마드 압델-할림은 코란에는 하나님과 마지막 날을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누구와도 싸울 근거가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부 하얀 알-가르나티는 "그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된다"라고 말한다. 아흐마드 알-마라기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71]
> [싸움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들과 싸우라. 즉, 당신이나 당신의 나라에 대한 공격, 당신의 신앙 때문에 당신에 대한 억압과 박해, 또는 당신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위협과 같이, 비잔틴인이 당신에게 저지른 행위는 타부크로 이어진다.
2.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가 금지한 것을 금지하지 않다"(''wa-lā yuḥarrimūna mā ḥarrama-llāhu wa-rasūluh'')
알-바이다위는 이슬람 국가에 속한 것을 불법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그들 자신의 성경과 선지자들이 합의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72] 이 구절에서 사자는 무함마드 또는 성서의 백성의 이전 메신저인 모세 또는 예수로 해석될 수 있다. 압델-할림은 후자가 올바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성서의 백성이 무함마드를 믿지 않거나 그가 금지한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므로, 그들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한 자신의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받고 있기 때문이다.
3. "진정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정의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wa-lā yadīnūna dīna'l-ḥaqq'')
많은 번역가들이 이 구절을 "진정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또는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 등으로 번역했다. 무함마드 압델-할림은 이 번역에 반대하며, 대신 ''dīna'l-ḥaqq''를 '정의의 규칙'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랍어 ''dāna''의 주된 의미는 '복종'이며, ''dīn''의 여러 의미 중 하나는 '행동'이다.[73] 페이루자바디는 'dīn'에 대해 열두 가지가 넘는 의미를 제시하며, '하나님 숭배, 종교'라는 의미는 하위에 둔다. ''Al-Muʿjam al-wasīṭ''는 "'dāna'는 좋든 나쁘든 어떤 일을 하는 습관이 있는 것이다; 'dāna bi-something'은 그것을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74] 동사 ''dāna''가 '믿다' 또는 '종교를 실천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전치사 ''bi''-가 뒤따른다(예: ''dāna bi'l-Islām''). 지즈야 구절은 ''lā yadīnūna bi-dīni'l-ḥaqq''가 아니라 ''lā yadīnūna dīna'l-ḥaqq''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압델-할림은 지즈야 구절에 맞는 의미는 '정의의 길(''al-ḥaqq'')을 따르지 않는 자', 즉 합의를 깨고 빚진 것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자라고 결론짓는다.
4. "그들이 손으로 지즈야를 지불할 때까지"(''ḥattā yu'ṭū-l-jizyata 'an yadin'')
''ʿan yad''(손에서/손으로)는 즉시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무슬림이 관대하게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75] 알-타바리는 '그것은 "그들의 손에서 받는 사람의 손으로"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M.J. 키스터는 '''an yad'''가 ''딤미''의 "능력과 충분한 수단"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76] 라시드 리다는 ''Yad''라는 단어를 은유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당 문구를 지즈야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의 재정적 능력과 관련시킨다.
5. "그들이 복종하는 동안"(''wa-hum ṣāghirūn'')
마크 R. 코헨은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무슬림의 굴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고 적었다. 지아우딘 아흐메드에 따르면, 대다수의 ''푸카하'' (이슬람 법학자)는 지즈야가 불신에 대한 굴욕을 주기 위해 비무슬림에게 부과되었다고 보았다. 반대로, 압델-할림은 이 굴욕의 개념이 코란의 다른 구절 및 예언적 ''ḥadīth''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77] 알-샤피이는 많은 학자들이 이 마지막 표현이 "이슬람 통치가 그들에게 시행된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고 썼다.[78][79][80] 이븐 카임 알-자우지야는 ''wa-hum ṣāghirūn''을 국가의 모든 신민이 법을 따르고, 성서의 백성의 경우 지즈야를 지불하도록 해석한다.
5. 고전 시대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는 짐미에게서 거두던 연공이나 조세를 뜻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친 것이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부터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즈야는 짐미에게서 걷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나 토지세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다시 말해, 이슬람 정권이 "짐마의 백성(ahl al-Dhimma)=짐미"에게 "보호(짐마)를 해주는 대가"로 걷는 세금이라는 성격이 분명해진 것이다.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근처에 사는 페르시아인 개종자 등이 이슬람 초기부터 무슬림이었음에도 아랍인 무슬림과 세금 부담에서 차별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우마르 2세는 이러한 불만을 알고, 짐미(이교도)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짐미와 마왈리(비 아랍인 개종자) 간의 조세 부담 차이를 없애려 했다. 그는 마왈리에게서 지즈야를 걷지 않으려 했고, 호라산 총독에게 "메카 방향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즈야를 면제하라"고 명령했다.[194] 이 명령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개종하여 세수가 줄어들자, 세금을 피하기 위해 개종하는 척만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할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러나 우마르 2세는 "신은 할례를 위해 무함마드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194]
8세기 중반 아바스 혁명으로 "신의 앞에서 무슬림은 평등하다"는 원칙이 실현되면서,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 차별이 없어졌다. 무슬림이라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를 내지 않았고, 아랍인이라도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라지(토지세)를 내야 했다. 16세기 이후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의 악바르는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를 회유하기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하지만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다시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냄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짐미(보호민)로서 생명, 재산,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았다. 지즈야는 본래 성서를 믿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즉 경전의 백성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슬람 세계가 넓어지면서 사실상 모든 비무슬림에게 적용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비무슬림에게는 무거운 부담이었고, 이슬람 정권에 복종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적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금전적,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많은 짐미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지즈야는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중요한 수입원이 되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꺼리는 분위기도 생겼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는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상 외 외국인에게서 걷은 지즈야를 자카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제정일치 국가를 세운 후에는 비무슬림에게 지즈야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지배하는 과격 단체 ISIL이 지배 지역 내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복고적인 이슬람 지배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198]
5. 1. 대상 및 면제
초기 아바스 왕조 시대의 율법학자들이 정립한 지즈야 부과 및 면제 규정은 그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6]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딤미 공동체 내에서 군 복무 연령의 성인, 자유인, 정신이 온전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종교적 직무가 없는 남성에게 지즈야를 납부하도록 요구했다.[6]지즈야 납부 대상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었다.[12]
하나피 학자 아부 유수프는 "노예, 여성, 어린이, 노인, 환자, 수도승, 은둔자, 정신 이상자, 맹인, 빈곤층은 세금에서 면제되었다"고 썼으며,[81]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구걸과 자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즈야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81] 한발리 율법학자 알-카디 아부 야알라는 "가난한 자, 노인, 만성 질환자에게는 지즈야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한다.[81]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두 번째 칼리프 우마르가 한 맹인 유대인과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면제를 허가했다고 한다.[6] 말리키 학자 알-쿠르투비는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는 지즈야는 사춘기를 넘긴 자유 남성의 머리에서만 징수하고, 여성, 어린이, 노예, 정신 이상자, 죽어가는 노인에게서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다"고 썼다.[85] 13세기 샤피이 학자 알-나와위는 "여성, 양성자, 부분적으로 자유가 주어진 노예, 미성년자, 정신병자는 '지즈야'에서 면제된다"고 썼다.[86][87] 14세기 한발리 학자 이븐 카임은 "노인, 만성 질환자, 맹인, 회복의 희망이 없고 건강을 포기한 환자는 충분한 재산이 있더라도 지즈야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썼다.[88] 이븐 카임은 네 개의 수니 마드합을 언급하면서 덧붙였다. "어린이, 여성, 정신 이상자에게는 지즈야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네 명의 이맘과 그들의 추종자들의 견해이다. 이븐 문디르는 '나는 그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븐 쿠다마는 알-무그니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89]
반대로, 샤피이 율법학자 알-나와위는 이렇게 썼다. "우리 학파는 병든 사람, 노쇠한 노인, 심지어 쇠약한 사람, 맹인, 수도승, 노동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납부를 주장한다. 연말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된 사람들에게는 지즈야 금액이 지급 능력이 생길 때까지 부채로 남았다."[86][87] 아부 하니파는 자신의 견해 중 하나에서, 그리고 아부 유수프는 수도승이 일하면 지즈야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0] 이븐 카임은 이븐 한발의 ''다히르'' 견해는 농민과 경작인 역시 지즈야에서 면제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90]
비록 ''지즈야''는 원래 경전의 사람들 (유대교, 기독교, 사비아교)을 위해 의무화되었지만,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모든 비무슬림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91][92] 따라서 아크바르를 제외한 인도 무슬림 통치자들은 통치하에 있는 힌두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시크교도에게서 ''지즈야''를 징수했다.[93] 아부 하니파와 아부 유수프와 같은 초기 이슬람 학자들은 지즈야를 모든 비무슬림에게 차별 없이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일부 후기 및 더 극단적인 율법학자들은 우상 숭배자에게 지즈야를 허용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기 위한 개종의 선택만 허용했다.[96]
11세기 이슬람 법학자 알 마와르디에 따르면 짐미 신분에 속하는 건강한 자유인 성인 남성에게 부과되었다. 가부장제 하에서 가구주가 될 수 없는 부인, 아이, 노예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양성 의혹이 있는 자에게도 부과되지 않지만, 그가 남성으로 판명될 경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과세되었다. 또한 정신 이상자에게도 부과되지 않았다.[199]
짐미 신분에 속하는 자유인 성인 남성이라도 노인이나 환자, 빈곤자의 경우에는 견해가 갈렸다. 알 마와르디는 빈곤자를 제외하고 지즈야가 부과된다고 언급하지만, 이 경우 모두 지즈야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설도 있었다.[200]
5. 2. 세율
지즈야 세율은 균일하지 않았으며,[102] 이슬람 경전은 세금에 고정된 제한을 두지 않았다.[103] 무함마드 시대에는 메디나, 메카, 카이바르, 예멘, 네즈란의 남성 딤미에게 1년에 1 디나르(دينار|디나르ar)가 부과되었다. 무함마드 하미둘라에 따르면, 세율은 "예언자 시대"에 1년에 10 디르함(درهم|디르함ar)이었지만, 이는 "평균적인 가족의 10일간의 지출"에 불과했다.[104]하룬 알-라시드 칼리프의 수석 카디인 아부 유수프는 세금에 대해 영구적으로 고정된 금액은 없었지만, 지불액은 일반적으로 재산에 따라 달랐다고 말한다. 아부 유수프의 ''키타브 알-카라지''는 부유층(예: 돈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48 디르함, 중간 재산층에게는 24 디르함, 장인 및 육체 노동자에게는 12 디르함을 정했다.[105] 또한, 원할 경우 현물로 지불할 수도 있었으며, 소, 상품, 가구, 심지어 바늘까지 화폐(동전) 대신 받을 수 있었지만,[108] 돼지, 술, 죽은 동물은 안 되었다.[107][108]
지즈야는 해당 지역 사람들의 부유함과 지불 능력에 따라 달랐다. 아부 우바이드 이븐 살람은 예언자가 예멘의 각 성인에게 1 디나르(당시 10 또는 12 디르함의 가치)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마르가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에게 부과한 것보다 적었는데, 높은 세율은 예멘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지불 능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109]
라시둔 칼리파조의 두 번째 칼리프인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가 그의 칼리파 기간 동안 고정하고 시행한 지즈야 세율은 적은 금액이었다. 부유층에게는 4 디르함, 중간 계층에게는 2 디르함, 임금을 받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활동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1 디르함이었다.[110]
13세기 학자 알-나와위는 "지즈야의 최소 금액은 1인당 1년에 1 디나르이다. 하지만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2 디나르, 부자에게는 4 디나르로 금액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썼다.[111] 아부 '우바이드'는 ''딤미''가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부담을 지거나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12]
학자 이븐 쿠다마 (1147년 – 1223년 7월 7일)는 지즈야 세율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한다.
학자 이븐 할둔 (1332년 – 1406년 3월 17일)은 지즈야에는 초과할 수 없는 고정된 제한이 있다고 말한다.[114] 샤피이 피크의 고전적인 매뉴얼인 ''여행자의 의존''에는 "비무슬림 인두세의 최소 금액은 1인당 1 디나르(n: 금 4.235g)이다(A: 1년에). 최대 금액은 양측이 합의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115][116]
8세기 중반의 아바스 혁명으로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어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상의 차별 대우가 철폐되었다. 무슬림이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는 부과되지 않았고,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라지 (토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이슬람 왕조로서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회유를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단,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짐미(보호민)로서 생명, 재산, 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얻었다. 지즈야는 본래 성서를 받드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이른바 경전의 백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외의 비무슬림에게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 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하위에 위치한 비무슬림에게는 가혹한 부담이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였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지즈야에 의한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된 점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는 풍조도 생겼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고 있는 현대의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대상 외의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하나피 학파는 부유한 자에게는 48디르함, 중류층에게는 24디르함, 하층 계급에게는 12디르함의 지즈야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리키 학파는 최고액과 최저액 모두 지배자의 자유라고 한다. 샤피이 학파는 최저액은 1디나르로 하고 최고액은 지배자의 자유라고 한다.[201]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1인당 월 700SAR 또는 800SAR로 하고 있다.[197]
5. 3. 징수 방법
알 가잘리는 지즈야가 "세상에 양심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불경한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104]마크 R. 코헨에 따르면, 지미가 지즈야를 납부할 때 굴욕적인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꾸란 자체에는 없지만, 일부 후대 무슬림들은 이를 "지미(비무슬림)를 굴욕적인 방법으로 격하시키는 모호한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13세기 하디스 학자이자 샤피이파 법학자인 알 나와위는 지즈야를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굴욕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는 쿠라산 학자들에 의해서만 언급된다. 다수의 학자들은 지즈야를 부드럽게 받아야 하며, 마치 빚을 받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확실하게 올바른 견해는 이러한 관행이 무효이며, 이를 고안한 자들은 반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언자나 정통 칼리프 중 누구도 지즈야를 징수할 때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언급했다.[117][118] 이븐 쿠다마 또한 이러한 관행을 거부했으며, 무함마드와 라시둔 칼리프들은 지즈야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징수하도록 권장했다고 언급했다.[119][120]
앤 램턴은 지즈야가 "굴욕적인 조건"에서 납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이것을 수라 아트 타우바 9:29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다음과 같다. "9:29) '''알라와 최후의 날을 믿지 않는 자들''' — 비록 그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지만, 알라와 그의 메신저가 금지한 것을 금지하지 않고, 참된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 — 그들이 손으로 공물을 바치고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엔나지와 다른 학자들은 일부 법학자들이 지즈야를 각자가 직접 나타나 말 대신 걸어서, 스스로 굴복한 자임을 확인하고 기꺼이 지불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한다.[121][122][123]
꾸란의 표준 주석 중 하나인 무타질리 저자 알 자마크샤리는 "지즈야는 그들에게서 멸시와 굴욕을 통해 받아야 한다. 지미는 말을 타지 않고 걸어서 직접 와야 한다. 그가 지불할 때, 그는 서 있어야 하고, 세금 징수인은 앉아 있어야 한다. 징수인은 그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면서 "지즈야를 내라!"라고 말해야 하고, 그가 지불하면 목덜미를 때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타프시르 이븐 아지바]의 Q9:29에 대한 주석에서 아흐마드 이븐 무함마드 이븐 아지바는 "지미는 그의 영혼, 행운, 욕망을 죽이라고 명령받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삶, 지도력, 명예에 대한 사랑을 죽여야 한다. [지미]는 그의 영혼의 갈망을 거꾸로 해야 하며,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짐을 실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수피 성자 아흐마드 시르힌디(1564–1624)는 편지 #163에서 "이슬람의 명예는 쿠프르와 카피르를 모욕하는 데 있다. 카피르를 존중하는 자는 무슬림을 모욕한다... 그들에게 지지야를 부과하는 진정한 목적은 그들을 굴욕시켜 잘 차려입고 웅장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떨려야 한다. 이는 그들을 멸시하고 이슬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썼다.
알 쿠르투비는 "지즈야를 지불할 수 있는데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즈야]에 대한 처벌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즈야를 지불할 수 없다면, 그는 면제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124] 다섯 번째 아바스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의 법학자 아부 유수프에 따르면, 지즈야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투옥되어 지불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지즈야 징수자는 관대함을 보이고 지불하지 못한 경우 신체적인 처벌을 피하도록 지시받았다. 만약 누군가가 지즈야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땅으로 무슬림 영토를 떠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붙잡힐 경우 노예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 처벌은 그 사람이 무슬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125]
지즈야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택 연금으로 처벌받았고, 일부 법적 권위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은 지미를 노예로 삼는 것을 허용했다.[126][127][128] 남아시아에서는 연간 지즈야를 지불하지 못한 지미 가족을 압류하는 것이 델리 술탄국과 무굴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판매되는 노예의 두 가지 주요 원천 중 하나였다.[129]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은 짐미로부터 징수된 연공이나 조세를 일반적으로 지칭했다.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한 것이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의 개종자가 증가하면서, 지즈야는 짐미로부터 징수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토지세로 하는 용어상의 구별이 정착하게 되었다. 즉, 이슬람 정권이 "짐마의 백성(ahl al-Dhimma)=짐미"에 대해 내리는 "보호(짐마)의 부과"로서 조세라는 성격이 명확해졌다.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근처에 사는 개종 페르시아인 등이 이슬람 대정복 시대 초기에 무슬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 무슬림과의 사이에 세금 부담의 불평등이 있는 것에 큰 불만을 품었다. 우마르 2세는 이러한 불만을 간파하고 짐미 (이교도)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장려하려 하여, 짐미와 마왈리 (비 아랍인 개종자)의 조세 부담에 차이를 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마왈리로부터의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려 했다. 호라산 총독에게 "메카 방향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모두 지즈야를 면제하라"고 명령한 것이 그 증거이다. 그 명령으로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나 세수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종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할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러나 우마르 2세는 "신은 할례를 위해 무함마드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194]
8세기 중반의 아바스 혁명에 의해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어, 그전까지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상의 차별 대우가 철폐되었다. 무슬림이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는 부과되지 않았고, 그 대신 "아랍의 특권"은 배제되어,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라지 (토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16세기 이후 이슬람 왕조로서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의 악바르는,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회유를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단,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짐미(보호민)로서 일정한 생명, 재산, 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얻었다. 지즈야는 본래 성서를 받드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이른바 경전의 백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외의 비무슬림에게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 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하위에 위치한 비무슬림에게는 가혹한 부담이 되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이러한 금전적,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많은 짐미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도 했다.
지즈야에 의한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된 점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는 풍조도 생겨, 이슬람 정권 하의 많은 국민이 비무슬림으로 남는 사례도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고 있는 현대의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대상 외의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제정일치의 국가를 수립한 후에는 비무슬림에 대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에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실효 지배하는 과격 단체 ISIL이, 지배 지역 내의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복고적인 이슬람 지배를 목표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198]
지즈야 징수 방식에는 짐미에게 굴욕감을 주는 여러 장치가 마련되었다. 지즈야 납세는 지방 유력자에게 납세자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이교도는 이슬람교도보다 아래'라는 일종의 데먼스트레이션이었다. 폭력뿐만 아니라 몸에 '불신앙의 무리'라고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공납 시 이러한 모욕적인 의례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도 있다. 과세에 관한 고전적인 논문을 쓴 아부 우바이드(Abū ʿUbayd)는 지즈야 과세가 짐미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거나 짐미에게 부담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207]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의 수석 판사였던 법학자 아부 유수프는 지즈야 징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207] "지즈야를 지불할 때 짐마의 백성 중 누구도 맞아서는 안 된다. 또한 더운 햇볕 아래 서게 하거나 그들의 몸에 혐오스러운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모든 행위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취급이 아니라, 그들은 관대함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슬람 정권에게 지즈야가 오히려 세수원으로 중요해졌다는 배경이 있다. 현대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등록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등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사무적으로 징수되고 있다.
5. 4. 세금 사용
이론적으로 지즈야 자금은 관료들의 급여, 군대에 대한 연금, 자선 사업에 사용되었다.[130][131] 그러나 실제로는 왕자의 개인 재무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132] 후대에는 이슬람 학자들이 술탄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기 위해 지즈야 수입을 할당받기도 했다.[133]지즈야 자금을 비무슬림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앤 램턴은 비무슬림이 지즈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134] 반면,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칼리프 우마르가 가난하고 병든 딤미들을 바이트 알-말(공공 재무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비무슬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83][135][136][137][138] 칼리드 빈 알-왈리드가 알-히라 사람들과 맺은 조약에서도 노약자, 장애인, 질병에 걸린 자,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자 등은 지즈야를 면제받고 바이트 알-말에서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139][140][141][142] 하산 샤는 비무슬림 여성, 어린이, 빈곤층, 노예는 지즈야가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공공 재무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46]
지즈야는 비무슬림에게 가혹한 부담이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기 때문에[143] 많은 비무슬림들이 굴욕으로 여겼다.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개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다.[144]
6. 역사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은 짐미에게서 징수한 연공이나 조세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다. 내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친 것이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즈야는 짐미에게서 징수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토지세로 하는 용어상의 구별이 자리 잡았다. 이슬람 정권이 "짐마의 백성(ahl al-Dhimma)=짐미"에 대해 내리는 "보호(짐마)의 부과"로서 조세라는 성격이 명확해졌다.[194]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근처에 사는 페르시아인 개종자들은 이슬람 대정복 시대 초기에 무슬림이 되었음에도, 아랍인 무슬림과의 세금 부담에 불평등이 있어 불만을 품었다. 칼리파 우마르 2세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짐미의 이슬람 개종을 장려하기 위해 짐미와 마왈리 (비 아랍인 개종자) 간 조세 부담 차등을 주장하며 마왈리의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려 했다. 그는 호라산 총독에게 "메카 방향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모두 지즈야를 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으로 집단 개종이 일어나 세수가 타격을 입자, 총독은 세금 회피 목적의 개종을 막기 위해 할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우마르 2세는 "신은 할례를 위해 무함마드를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194]
8세기 중반 아바스 혁명으로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면서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 차별이 철폐되었다. 무슬림은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를 부과받지 않았고,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면 하라지 (토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지즈야는 주로 비무슬림에게 부과되었지만, 16세기 이후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 악바르 황제는 힌두교도 회유를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그러나 아우랑제브 황제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 납부를 통해 짐미(보호민)로서 생명, 재산, 종교적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받았다. 지즈야는 본래 성서를 따르는 유대교도나 기독교도 등 경전의 백성에게 적용되었으나, 이슬람 세계 확대로 사실상 모든 비무슬림에게 적용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비무슬림에게 가혹한 부담이자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였기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굴욕으로 여겼다. 이들은 금전적 부담과 사회적 차별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거나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뭄바이로 도망간 사산 왕조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는 인도에서 페르시아인을 뜻하는 "파르시"로 불렸다.
지즈야의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 개종을 강요했지만, 지즈야가 중요 재원이 되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해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꺼리는 풍조도 생겨, 많은 국민이 비무슬림으로 남기도 했다. 이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콩키스타 성공의 한 원인이 되었다. 레콩키스타 이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된 유대교도를 오스만 제국이 "지즈야 납부 백성"으로 환영한 사례도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는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서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처럼 사회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제정일치 국가 수립 후 비무슬림에게 지즈야 부과를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실효 지배하는 ISIL이 지배 지역 내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는 복고적 이슬람 지배를 목표로 한 것으로 지적되었다.[198]
6. 1. 기원
지즈야의 기원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바스 왕조의 저자들은 이전 역사 기록을 체계화하면서 당시의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지즈야를 해석했다. 아랍 정복으로 확립된 체계는 균일하지 않았고, 다양한 합의나 결정의 결과였다. 또한 이 체계의 기초가 된 이전의 과세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하게 이해되고 있다.[146]윌리엄 몽고메리 와트는 지즈야의 기원을 아라비아 유목민들 사이의 이슬람 이전 관행에서 찾고 있는데, 강력한 부족이 보호가 효과가 없을 경우 환불될 조공을 대가로 더 약한 이웃을 보호하는 데 동의했다.[146] 로버트 호일랜드는 이를 원래 "정복된 사람들"이 대부분 아랍인 정복자들에게 지불하는 인두세였지만, 나중에는 "비무슬림만 지불해야 하는 종교세"가 되었다고 설명한다.[147]
아라비아 반도의 일부 남부 및 동부 지역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무함마드의 생애 동안 이슬람 국가에 '지즈야'라는 조공을 지불하기 시작했다.[17] 이는 원래 나중에 그렇게 될 인두세가 아니라 연간 생산량의 일정 비율과 고정된 양의 상품이었다.[17]
630년 타북 원정 동안 무함마드는 북부 히자즈와 팔레스타인의 네 도시에 군대 유지를 포기하고 세금 지불을 대가로 무슬림에게 안보를 의존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148] 모셰 길은 이 텍스트가 후속 초기 무슬림 정복 동안 무슬림 지도자들이 발행할 안보 서한의 패러다임을 나타내며, 나중에 인두세의 의미를 갖게 될 '지즈야'라는 단어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148]
지즈야는 630년에 코란 구절(9:29)에 이 단어가 언급되면서 신성한 승인을 받았다.[17] 막스 브라브만은 코란에서 '지즈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슬람 이전의 관습법 원칙, 즉 재량에 따른 선행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204]
632년, 인두세 형태의 지즈야는 무함마드가 예멘에 보냈다고 전해지는 문서에 처음 언급되었다.[17] W. 몽고메리 와트는 이 문서가 초기 무슬림 역사가들에 의해 나중의 관행을 반영하도록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노먼 스틸먼은 이것이 진본이라고 주장한다.[17]
지즈야는 이슬람 초창기에 이슬람 정권의 보호를 받은 짐미로부터 징수된 연공이나 조세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었다.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지세와 인두세를 합한 것이었다. 우마이야 왕조 말기 이후 이슬람으로의 개종자가 증가하면서, 지즈야는 짐미로부터 징수되는 인두세, 하라지는 지세·토지세로 하는 용어상의 구별이 정착하게 되었다.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이슬람 대정복 시대 초기에 무슬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 무슬림과의 사이에 세금 부담의 불평등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었다. 칼리파 우마르 2세는 짐미와 마왈리 (비 아랍인 개종자)의 조세 부담에 차이를 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마왈리로부터의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려 했다.
8세기 중반의 아바스 혁명에 의해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어,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상의 차별 대우가 철폐되었다. 무슬림이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는 부과되지 않았고,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라지 (토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힌두교도의 회유를 위해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단,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지불함으로써, 짐미(보호민)로서 생명, 재산, 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얻었다. 지즈야는 본래 경전의 백성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외의 비무슬림에게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의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무슬림에 대한 것이 되었다.[195]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하위에 위치한 비무슬림에게는 가혹한 부담이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이러한 금전적 부담과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 많은 짐미가 다른 지역으로의 도망이나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선택하기도 했다.
지즈야에 의한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된 점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는 풍조도 생겼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비무슬림에 대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에 ISIL이 지배 지역 내의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198]
6. 2. 고전적 과세 체계의 등장
초기 이슬람 정복 이후 정복지의 주민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개인에게 부과되는지, 토지에 부과되는지, 아니면 집단 공물로 부과되는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초기 1세기 동안 '지즈야'와 '하라지'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개인세와 토지세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었다. ("머리에 대한 하라지", "토지에 대한 지즈야" 등)[194]처음에는 과세의 지역적 차이가 이전 사산 왕조와 비잔틴 제국의 과세 시스템의 다양성을 반영했다. 사산 제국은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과 부에 따라 세율이 다른 인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귀족은 면제되었다. 이라크에서는 등급별 인두세를 유지하고 세율을 인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귀족 면제는 새로운 아랍-무슬림 엘리트가 받아들였으며, 개종을 통해 지역 귀족과 공유했다. 시리아와 상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고정된 세율(일반적으로 머리당 1 디나르)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세금이 계산되었다. 이집트에서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토지세와 머리당 2 디나르의 인두세를 결합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과세했다. 이란과 중앙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 통치자는 고정된 공물을 지불하고, 사산 제국의 이중 세금 제도를 사용하여 과세 자율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곧 나타났다. 이집트 콥트교도들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등록된 지역을 떠나 세금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동 통제를 도입했다. 이라크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랍 주둔 도시로 토지를 버렸다. 알-하지하즈는 농민 개종자들에게 토지로 돌아가 다시 세금을 부과하도록 강요하여 농민의 이슬람 개종을 사실상 금지했다. 호라산에서는 토착 귀족이 세금 징수 부족분을 자비로 보충하도록 강요했고, 이에 그들은 농민 개종자를 박해하고 가난한 무슬림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이 처벌받는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우마이야 칼리프 우마르 2세가 과세 시스템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마르 2세는 총독들에게 무슬림 개종자로부터 세금 징수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지만, 그의 후계자들은 이 정책을 방해했다. 일부 총독은 할례를 받고 코란 구절을 암송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추가 요건을 도입하여 개종의 흐름을 막으려 했다.[194] 호일랜드에 따르면, 비 아랍 무슬림의 과세 관련 불만은 압바스 혁명을 초래한 반대 운동에 기여했다.
결국 확립된 새로운 시스템에서 하라지는 납세자의 종교와 상관없이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간주되었다. 인두세는 더 이상 무슬림에게 부과되지 않았지만, 국고가 반드시 손실된 것은 아니었고 개종자가 이익을 얻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730년경 무슬림에게 의무적인 세금으로 제정된 자카트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압바스 시대에 용어가 전문화되어, '하라지'는 더 이상 토지세 외에 다른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지즈야"라는 용어는 딤미의 인두세로 제한되었다.[194]
6. 3. 인도
인도에서는 11세기부터 이슬람 통치자들이 비무슬림에게 ''지즈야''를 부과했다.[150] 이 과세 관행에는 ''지즈야''와 ''하라지''세가 포함되었는데, 이 용어들은 때때로 인두세와 공동 공물, 또는 단순히 ''하라지-오-지즈야''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51]델리 술탄국 시대에 지즈야는 확대되었다. 알라웃딘 할지는 지즈야와 하라지 체납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합법화했다. 그의 관리들은 술탄국의 도시들이 확장되면서 노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압수하여 판매했다.[152] 무슬림 궁정 역사가 지아우딘 바라니는 카지 무기스딘 오브 바이아나가 알라 앗-딘에게 이슬람은 힌두교도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고 힌두교도를 굴욕시키기 위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며, 지즈야를 부과하는 것은 술탄의 종교적 의무라고 조언했다고 기록했다.[153]
무함마드 빈 투글라크의 14세기 초 통치 기간 동안, 인도 전역에 걸친 값비싼 침략과 군대의 일부를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중국을 공격하라는 그의 명령은 술탄국의 금속 자원을 고갈시켰다.[155][154] 그는 귀금속의 액면 가치를 가진 저급 금속으로 동전을 주조하라고 명령했다. 이 경제적 실험은 실패했는데, 술탄국 내 힌두교도들이 집에서 저급 금속으로 위조 동전을 만들어 지즈야를 지불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155][156] 14세기 후반, 투글라크 왕조의 술탄 피로즈 샤 투글라크의 회고록에는 그의 전임자가 모든 힌두교도에게 세금을 부과했지만 모든 힌두교 브라만은 지즈야에서 면제했으며, 피로즈 샤는 이를 브라만에게도 적용하되 낮은 세율로 적용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159][157] 그는 또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모든 힌두교도는 세금과 지즈야에서 면제되고 그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159][158] 힌두교로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지즈야 세금을 인상했다.[159]
카슈미르에서는 시칸다르 부트시칸이 세습적 ''바르나''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즈야를 부과했는데, 이는 그의 개종한 장관 수하바타의 사주를 받았다고 한다.[160][161] 아흐마드 샤(1411-1442)는 1414년에 지즈야를 도입하여 매우 엄격하게 징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162]

지즈야는 이후 3대 무굴 제국 황제 악바르에 의해 1564년에 폐지되었다.[163][164] 그러나 1679년에 아우랑제브는 군 복무 대신 비무슬림에게 지즈야를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많은 힌두교 통치자와 무굴 궁정 관리들의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165][164][166][167] 구체적인 금액은 피지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달랐으며,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 징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승려, 무스타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실업자, 환자, 정신병자는 모두 영구적으로 면제되었다.[168][166][169] 징수인은 무슬림으로 지정되었다.[164] 일부 지역에서는 반란으로 인해 지즈야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아우랑제브가 인도 데칸 고원 지역에서 1704년에 지즈야를 중단한 경우가 있다.[170]
6. 4.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노르만 정복 이후, 무슬림 소수에게 부과된 세금 또한 "지즈야"(현지에서는 "기지아")라고 불렸다.[171] 이 인두세는 시칠리아 토후국과 바리 토후국에서 노르만 정복 이전에 남부 이탈리아의 이슬람 역사의 이슬람 통치자들이 비무슬림에게 부과했던 지즈야의 연장선이었다.[171]6. 5. 오스만 제국
데브시르메도 참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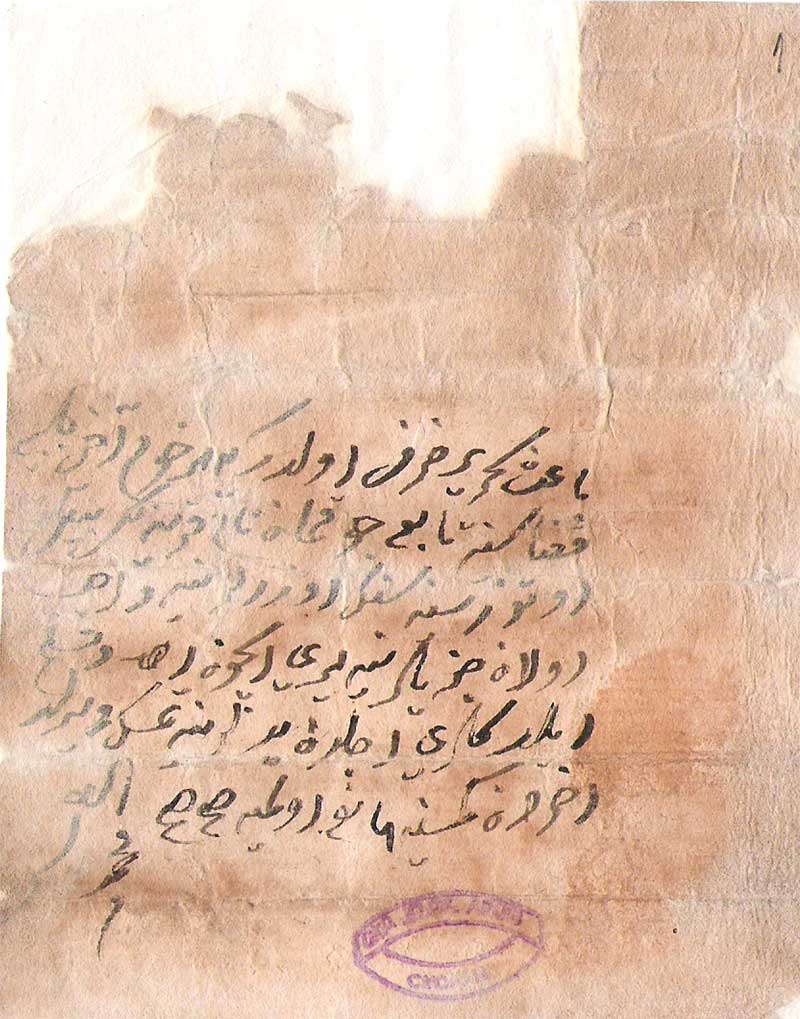
기독교 및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징수된 지즈야는 오스만 재무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였다.[16] 레바논과 이집트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또는 유대인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지즈야를 납부했으며, 이를 "마크투"라고 불렀다. 이 경우 지즈야 세금의 개별 요율은 공동체가 지불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여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었다.[172][173]
오스만 제국은 또한 서부 아나톨리아와 발칸 반도의 로마니족과 카스타모누, 창키리-토스야, 앙카라, 말라티아, 하르푸트, 안테프, 알레포의 압달족, 돔족, 롬족과 같은 집시(크프티)로 등록된 무슬림 및 비무슬림 그룹으로부터도 지즈야를 징수했다. 17세기 후반까지 테케(안탈리아)의 압달족과 타흐트츠는 1858년까지 이프라즈-이 줠카드리예라는 다른 재정 범주와 관련이 있었고, 오스만 개혁가들이 관련 그룹의 고정 세금을 집시 인두세에 통합했다.[174]
6. 6. 폐지
이란(페르시아)에서는 1884년 카자르 왕조에 대한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개량 기금의 압력으로 조로아스터교 소수 민족의 지즈야 납부가 폐지되었다.[175]오스만 제국은 1856년에 지즈야를 폐지하고, 비무슬림이 군 복무 대신 납부하는 '바달-아스카리'(군사 대체)라는 새로운 세금으로 대체했다. 이 세금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군 복무에서 면제해주는 세금이었다.[177]
인도를 지배한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1564년 인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도의 회유를 위해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다. 단,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19세기에 알제리와 튀니지에서 지즈야가 폐지되었지만, 모로코에서는 20세기 초까지 징수되었다 (이 세 폐지 날짜는 이들 국가에 대한 프랑스 식민지화와 일치한다).[176]
6. 7. 현대
지즈야는 더 이상 이슬람 국가에서 부과되지 않는다.[20] 하지만 파키스탄 탈레반과 ISIS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비무슬림에게 지즈야를 강제로 지불하도록 강요했다는 보고가 있다.[19][23]2009년, 파키스탄 페샤와르 지역의 관리들은 탈레반이 일부 시크교도들의 집을 점거하고 시크교 지도자를 납치한 후 파키스탄의 소수 시크교도들에게 ''지즈야''를 강제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178]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는 시리아 라까에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지즈야를 징수할 의사를 발표했다.
6월, 전쟁 연구소는 ISIL이 파이, 즉 지즈야와 하라지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179]
파키스탄 출신의 이슬람 학자 아불 알라 마우두디는 무슬림 국가에서 지즈야를 비무슬림에게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유수프 알-카라다위 또한 1980년대 중반에 그 입장을 고수했다.[180]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법적 견해를 재고하여 "오늘날, 징병제가 모든 시민—무슬림과 비무슬림—에게 의무화된 후에는 지즈야 또는 그 외의 명목으로 어떠한 지불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181] 칼레드 아부 엘 파들에 따르면, 온건한 무슬림들은 일반적으로 지즈야를 포함하는 딤미 제도를 민족 국가와 민주주의 시대에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한다.[21]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 자국민에게 자카트를 부과하고 있는 현대의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대상 외의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자카트와 마찬가지로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샤리아에 기초한 제정일치의 국가를 수립한 후에는 비무슬림에 대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에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를 실효 지배하는 과격 단체 ISIL이, 지배 지역 내의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복고적인 이슬람 지배를 목표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198]
7. 평가 및 역사적 맥락
일부 학자들은 압바스 시대 이전의 토지세와 인두세의 복합적인 형태, 그리고 근대 초 남아시아에서 지즈야 인두세 시행을 차별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으로 묘사해 왔다.[182][183][184] 알-나와위와 이븐 쿠다마 등 다수의 이슬람 학자들은 지즈야 징수의 굴욕적인 측면이 이슬람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117][185][186]
W. 클리블랜드와 M. 번턴은 딤미(dhimma) 지위가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나타냈으며, 비잔틴 제국의 관행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비잔틴 및 페르시아 통치에서 아랍 통치로의 변화는 세금을 낮추고 딤미들이 공동 자치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한다.[188] 버나드 루이스는 비잔틴 통치에서 아랍 통치로의 변화가 세금과 기타 문제에서 이전의 멍에보다 훨씬 가볍다고 생각한 피지배 계층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189]
이라 라피두스는 아랍-이슬람 정복이 정착된 지역에 대한 유목민 정복의 일반적인 패턴을 따랐다고 기록한다. 정복자들은 새로운 군사 엘리트가 되었고, 이전 엘리트들은 지역 정치, 종교 및 재정적 권위를 유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타협점에 도달했다. 농민, 노동자 및 상인들은 세금을 냈고, 이전과 새로운 엘리트들은 세금을 징수했다.[190] 다양한 세금 납부, 특히 농민의 경우 생산 가치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 납부는 경제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열등함의 표식이기도 했다.[190]
노먼 스틸먼은 초기 이슬람 통치 하의 유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이전 통치자들 하의 세금 부담과 유사했지만,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인(페르시아 제국의 기독교인은 제외, 이들의 지위는 유대인과 유사했음)과 이란의 조로아스터교인들은 아랍 정복 직후에 훨씬 더 무거운 부담을 짊어졌다고 적고 있다. 그는 억압적인 세금과 사회적 열등함으로부터의 탈출이 개종과 아랍 주둔지로의 도피에 대한 "큰 유인"이 되었다고 한다.
지즈야가 개종에 미치는 영향은 학문적 논쟁의 대상이었다.[191] 율리우스 벨하우젠은 인두세가 너무 적어 그 면제가 개종에 충분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워커 아놀드는 지즈야가 "너무 온건"하여 부담이 되지 않으며, 무슬림 동료 시민들에게 부과된 의무적인 군 복무로부터 딤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고 덧붙였다.[192]
마크 R. 코헨은 굴욕적인 의미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통치 하의 유대인들이 지불한 지즈야는 라틴 서방의 유대인들이 소유한 것보다 "비유대인의 적대 행위로부터 더 확실한 보호 보장"을 제공했다고 한다.
야세르 엘레티는 지즈야의 "미미한 액수"뿐만 아니라 그 점진적인 구조와 면제가 사람들이 박해를 받거나 개종을 강요하기 위해 부과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니아즈 A. 샤는 지즈야가 부분적으로 상징적이고 부분적으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며, 그 액수가 미미하고 면제가 많기 때문에 상징적 성격이 우세하다고 평가한다.
민족지학자 셸로모 도브 고이테인은 지즈야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및 기타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비무슬림 자료 없이 연구하는 것의 한계를 강조했다.[193]
2016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무슬림 학자들은 마라케시 선언에 서명했는데, 이는 딤미 시스템이 현대 시대에 구식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102]
우마이야 왕조에서는 수도 다마스쿠스가 있는 시리아 근처에 사는 개종 페르시아인 등이 아랍인 무슬림과의 세금 부담 불평등에 불만을 품었다. 우마르 2세는 마왈리(비 아랍인 개종자)로부터의 지즈야 징수를 중지하려 했다.
8세기 중반의 아바스 혁명으로 "신의 앞에서 무슬림의 평등"이 실현되어 비 아랍인에 대한 조세상의 차별 대우가 철폐되었다. 무슬림이면 비 아랍인이라도 지즈야는 부과되지 않았고, 아랍인이라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라지(토지세)가 부과되었다.
무굴 제국 제3대 황제 악바르는 1564년 지즈야 징수를 폐지했으나, 제6대 아우랑제브는 비무슬림에 대한 지즈야를 부활시켰다.
지즈야는 이슬람 사회에서 무슬림보다 하위에 위치한 비무슬림에게는 가혹한 부담이었고, 이슬람 정권에 대한 복종의 증거였기 때문에[196], 많은 비무슬림은 지즈야를 굴욕으로 여겼다.
지즈야에 의한 가혹한 부담은 비무슬림에게 암묵적으로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지즈야가 중요한 재원이 된 점에서 오히려 세수 감소를 우려하여 무슬림으로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는 풍조도 생겼다.
사우디 아라비아[197] 등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징수한 지즈야를 사회 복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 중에는 비무슬림에 대해 지즈야를 부과할 것을 표방하는 단체가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2014년에 ISIL이 지배 지역 내의 기독교도에게 인두세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198]
참조
[1]
서적
Understanding the Qur'ān: Themes and Style
https://archive.org/[...]
I. B. Tauris & Co Ltd
2010-01-01
[2]
간행물
The American Journal of Islamic Social Sciences
Oxford
2006-01-01
[3]
서적
Sacred Precincts: The Religious Architecture of Non-Muslim Communities Across the Islamic World
BRILL
2014-01-01
[4]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01-01
[5]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01-01
[6]
서적
Is Jihād a Just War?: War, Peace, and Human Rights Under Islamic and Public International Law (Studies in religion & society)
https://archive.org/[...]
Edwin Mellen Press
[7]
서적
Sharī'a: Theory, Practice and Transform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01-01
[8]
학술지
Islamic Law, Practice, and Legal Doctrine: Exempting the Poor from the ''Jizya'' under the Ayyubids (1171–1250)
[9]
서적
Disability in Islamic law
https://archive.org/[...]
Springer
2007-01-01
[10]
서적
War and Peace in the Law of Islam
[11]
서적
The Princeton encyclopedia of Islamic political though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01-01
[12]
서적
International Society: Diverse Ethical Perspectiv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01-01
[13]
서적
Iraq after the Muslim conquest
Gorgias Press
[14]
서적
The social structure of Islam
Routledge
[15]
학술지
Jizyah and the State in India during the 17th Century
https://www.jstor.or[...]
1969-01-01
[16]
서적
Ottoman Palestine, 1800–1914 : Studies i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E.J. Brill
[17]
서적
al-Islām fī Qafaṣ al-ʾIttihām
https://archive.org/[...]
Dār al-Fikr
2006-01-01
[18]
서적
Zahrat al-Tafāsīr
Dār al-Fikr al-ʿArabī
[19]
백과사전
Jizya
https://books.googl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
서적
Islam in the World Today
https://books.google[...]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01-01
[21]
서적
The Great Theft: Wrestling Islam from the Extremists
HarperOne
2007-01-01
[22]
뉴스
Coming home to Orakzai
http://www.dawn.com/[...]
Dawn.com
2010-01-05
[23]
잡지
Al-Qaeda Rebels in Syria Tell Christians to Pay Up or Die
https://world.time.c[...]
2014-02-28
[24]
웹사이트
JEZYA
https://iranicaonlin[...]
Encyclopædia Iranica Foundation, Brill Academic Publishers
2024-04-07
[25]
서적
Notes 1281 and 1282 to verse 9:29
1991-01-01
[26]
서적
Mufradāt ] ʾal-Faẓ al-Qurʾān
https://archive.org/[...]
Dār al-Qalam
[27]
서적
Mufradāt ʾal-Faẓ al-Qurʾān
https://archive.org/[...]
Dār al-Qalam
2009-01-01
[28]
서적
Al-Jihād fī'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Fikr
2005-01-01
[29]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01-01
[30]
서적
Al-Jihād fī'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Fikr
2005-01-01
[31]
서적
An Arabic-English Lexicon
[32]
학술지
Ahl Al-Kitab and Religious Minorities in the Islamic State: Historical Context and Contemporary Challenges
2000-04-01
[33]
서적
Iraq after the Muslim conquest
Gorgias Press
[34]
서적
Encyclopedia of the Qur'an
Brill Academic
2011-01-01
[35]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01-01
[36]
서적
Taxation in Islam
Brill Academic
1967
[37]
서적
Arabic-English Lexicon
https://books.google[...]
1865
[38]
서적
Alternative paradigms : the impact of Islamic and Western Weltanschauungs on political theor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39]
서적
The Great Theft: Wrestling Islam from the Extremists
HarperOne
2007
[40]
서적
Muhammad: A Very Short Introduction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41]
서적
Al-Jihād fī'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Fikr
2005
[42]
서적
al-Islām wa'l-ʿaqalliyyāt
https://archive.org/[...]
Maktabat al-Shurūk al-Dawliyya
2003
[43]
서적
Umar: Makers of Islamic Civilization
I.B. Tauris
[44]
서적
Majallat al-Manār
https://archive.org/[...]
[45]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
[46]
학술지
The concept of Al-Dhimmah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Dhimmis in an Islamic state
[47]
서적
ʾAḥkām al-Dhimmiyīn wa-l-mustaʾminīn fī dār a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Quds – Muʾassassat al-Risālah
[48]
서적
Majallat al-Manār
https://archive.org/[...]
[49]
서적
Ghayr al-Muslimīn fī al-Mujtamaʿ al-ʾIslāmī
https://archive.org/[...]
Maktabat Wahbah
1992
[50]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
[51]
서적
ʾĀthar al-ḥarb fī l-fiqh al-Islāmī : dirāsah muqārinah
https://archive.org/[...]
Dār al-Fikr
[52]
서적
ʾAḥkām al-Dhimmiyīn wa-l-mustaʾminīn fī dār a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Quds – Muʾassassat al-Risālah
[53]
서적
ʾĀthar al-ḥarb fī l-fiqh al-Islāmī : dirāsah muqārinah
https://archive.org/[...]
Dār al-Fikr
[54]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
[55]
서적
Ghayr al-Muslimīn fī al-Mujtamaʿ al-ʾIslāmī
https://archive.org/[...]
Maktabat Wahbah
1992
[56]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
[57]
학술지
The concept of Al-Dhimmah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Dhimmis in an Islamic state
[58]
서적
ʾĀthar al-ḥarb fī l-fiqh al-Islāmī : dirāsah muqārinah
https://archive.org/[...]
Dār al-Fikr
[59]
웹사이트
Nidhām ʾAhl al-Dhimma, Ruʾyah Islāmiyah Muʿāssira
http://www.islamonli[...]
2005-07-13
[60]
서적
Scriptural Polemics: The Qur'an and Other Relig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61]
백과사전
Jizyah
http://www.oxfordref[...]
Oxford University Press
[71]
서적
Tafsīr Al-Maraghī
https://ar.wikisourc[...]
[72]
서적
Tafsīr
Dār al-Kutub al-ʿIlmiyya
[73]
서적
al-Qamūs al-muḥīṭ
Dār al-Jīl
[74]
서적
al-Tafsīr al-kabīr
Majmaʿ al-Lugha al-ʿArabiyya
[75]
서적
The Study Quran: A New Translation and Commentary
[76]
논문
"'An yadin (Qur'an IX/29): An Attempt at Interpretation"
[77]
웹사이트
Sahih al-Bukhari 2076 – Sales and Trade – Sunnah.com – Sayings and Teachings of Prophet Muhammad (صلى الله عليه و سلم)
https://sunnah.com/b[...]
[78]
서적
Kitabul Umm
[79]
서적
ʾĀthar al-ḥarb fī l-fiqh al-Islāmī : dirāsah muqārinah
https://archive.org/[...]
Dār al-Fikr
[80]
서적
Fiqh al-Jihād: Dirāsah Muqāranah li-Aḥkāmih wa Falsafatih fī Ḍawʾ al-Qurʾān wa al-Sunnah.
https://archive.org/[...]
Maktabat Wahbah
2009-01-01
[81]
서적
al-Aḥkām al-Sulṭāniyyah
[82]
서적
al-Islām wa'l-ʿĀkhar — Dirāsah ʿan Waḍʿiyat Ghayr al-Muslimīn fī Mujtamaʿāt al-Muslimīn
https://archive.org/[...]
Maktabat al-Rushd
2008-01-01
[83]
서적
Fatwa on Terrorism and Suicide Bombings
Minhaj-ul-Quran
2011-01-01
[84]
서적
ʾĀthar al-ḥarb fī l-fiqh al-Islāmī : dirāsah muqārinah
https://archive.org/[...]
Dār al-Fikr
[85]
서적
Al-Jami' li Ahkam al-Qur'an
[86]
서적
Minhaj al-Talibin
[87]
서적
Minhaj et talibin: a manual of Muhammadan law
Adam Publishers
[88]
서적
Ahkam Ahl al-Dhimma
[89]
서적
Ahkam Ahl Al-Dhimma
[90]
서적
Ahkam Ahl Al-Dhimma
[91]
서적
Ceremonies of Possession in Europe's Conquest of the New World, 1492–164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10-27
[92]
서적
Refuting ISIS: A Rebuttal Of Its Religious And Ideological Foundations
Sacred Knowledge
[93]
서적
A History of Modern India: 1480–1950
Anthem Press
[94]
서적
The Delhi Sultanate : a political and military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95]
서적
Emperors of the peacock throne : the saga of the great Mughals
https://archive.org/[...]
Penguin Books
[96]
저널
Political conditions of the Hindus under the Khaljis
[97]
서적
Sephardic studies in the university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98]
서적
Conversion and the Poll Tax in Early Islam
Harvard University Press
[99]
논문
"Evidence on the Muslim Poll Tax from Non-Muslim Sources"
[100]
서적
Islamic Law in Action: Authority, Discretion, and Everyday Experiences in Mamluk Egypt
OUP Oxford
2016-01-19
[101]
백과사전
Encyclopaedia Judaica, 2nd Edition, Volume 12
Thomson Gale
[102]
웹사이트
jizyah, Islamic tax
https://www.britanni[...]
2021-11-10
[103]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01-01
[104]
서적
Introduction to Islam
International Islamic Federation of Student Organizations
1970-01-01
[105]
서적
[106]
논문
The concept of Al-Dhimmah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Dhimmis in an Islamic state
[107]
서적
Ghayr al-Muslimīn fī al-Mujtamaʿ al-ʾIslāmī
https://archive.org/[...]
Maktabat Wahbah
1992
[108]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
[109]
간행물
The Spread of Islam Throughout the World
[110]
문서
Maariful Quran
[111]
서적
Minhaj et talibin: a manual of Muhammadan law
Adam Publishers
2005
[112]
서적
Alternative paradigms: the impact of Islamic and Western Weltanschauungs on political theory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4
[113]
서적
Al-Mughni
[114]
서적
The Muqaddimah : an introduction to history ; in three volum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15]
웹사이트
Reliance of the Traveller
http://www.catheyall[...]
2020-05-14
[116]
웹사이트
A Classic Manual of Islamic Scared Law
http://dailyrollcall[...]
2020-05-14
[117]
문서
Rawḍat al-Ṭālibīn wa ‛Umdat al-Muftīn
al-Maktab al-Islamiy
[118]
서적
Al-Jihād fī'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Fikr
2005
[119]
서적
Al-Jihād fī'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Fikr
2005
[120]
문서
Al-Mughni
[121]
서적
Slavery, the state, and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2]
서적
Islamic theories of finance : with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 and a bibliography
Gorgias Press
[123]
서적
Between foreigners and Shi'is : nineteenth-century Iran and its Jewish minor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24]
문서
Ahkam al-Qur'an
[125]
서적
Slavery in the History of Muslim Black Africa
NYU Press
2001
[126]
서적
Race and Slavery in the Middle East: An Historical Enquiry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27]
서적
Poverty and Charity in the Jewish Community of Medieval Egyp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128]
서적
Islam in Iran
SUNY Press
1995
[129]
논문
Hindu Beyond Hindu Kush: Indians in the Central Asian Slave Trade
2002
[130]
서적
Islamic Capitalism and Finance: Origins, Evolution and the Future
2011
[131]
서적
Social Welfare in Muslim Societies in Africa
[132]
서적
Social Welfare in Muslim Societies in Africa
[133]
서적
Aḥkām al-Ḥarb wa al-Salām fī Dawlat al-Islām
Dār al-Numayr
1993
[134]
서적
Economic Development and Islamic Finance
World Bank Publications
2013-08-05
[135]
서적
Samahat al-Islam
https://books.google[...]
Maktabat al-'Adib
[136]
서적
Economic Development and Islamic Finance
[137]
서적
Umar: Makers of Islamic Civilization
I.B. Tauris
[138]
서적
Le Prophète de l'Islam : Sa vie, Son œuvre
El-Najah
1998
[139]
서적
ʾĀthar al-ḥarb fī l-fiqh al-Islāmī : dirāsah muqārinah
https://archive.org/[...]
Dār al-Fikr
[140]
서적
Kitāb al-Kharāj
Dār al-Maʿrifah
[141]
서적
Aḥkām al-Ḥarb wa al-Salām fī Dawlat al-Islām
Dār al-Numayr
1993
[142]
서적
Ghayr al-Muslimīn fī al-Mujtamaʿ al-ʾIslāmī
https://archive.org/[...]
Maktabat Wahbah
1992
[142]
서적
Fiqh al-Jihād: Dirāsah Muqāranah li-Aḥkāmih wa Falsafatih fī Ḍawʾ al-Qurʾān wa al-Sunnah
https://archive.org/[...]
Maktabat Wahbah
2009
[143]
문서
In God's Path
2015
[144]
서적
Ceremonies of Possession in Europe's Conquest of the New World, 1492–1640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02-21
[145]
서적
Ceremonies of Possession in Europe's Conquest of the New World, 1492–1640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02-21
[146]
문서
1980
[147]
문서
In God's Path
2015
[148]
서적
A History of Palestine: 634–1099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149]
서적
Religious Pluralism and Islamic Law: Dhimmis and Others in the Empire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50]
서적
The Delhi Sultanate: A Political and Military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51]
서적
Economic History of Medieval India, 1200–1500
[152]
간행물
The Delhi Sultanate: A Slave Society or A Society with Slaves?
2009
[153]
서적
The History of India, as Told by Its Own Historians. The Muhammadan Period (Vol 3.)
London, Trübner & Co.
[154]
서적
A Brief History of the Indian Peoples
1903
[155]
서적
The Oxford History of India: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End of 1911
Oxford University Press
[156]
웹사이트
Muḥammad ibn Tughluq
https://www.britanni[...]
2009
[157]
웹사이트
Futuhat-i Firoz Shahi
https://archive.org/[...]
[158]
서적
Islam in the Indian Subcontinent
Brill Academic
1997
[159]
서적
The Oxford History of India: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End of 1911
Oxford University Press
[160]
서적
Kingship in Kaśmīr (AD 1148‒1459); From the Pen of Jonarāja, Court Paṇḍit to Sulṭān Zayn al-‛Ābidīn
2014
[161]
서적
Brahma's Curse : Facets of Political and Social Violence in Premodern Kashmir
https://www.academia[...]
[162]
서적
The Rise of Muslim Power in Gujarat
1963
[163]
웹사이트
Satish Chandra History Of Medieval India
https://archive.org/[...]
[164]
서적
Aurangzeb : The Life and Legacy of India's Most Controversial King
https://www.degruyt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07-20
[165]
웹사이트
Aurangzeb, Akbar, and the Communalization of History
http://southasia.ucl[...]
[166]
웹사이트
Aurangzeb's Fatwa on Jizya
http://southasia.ucl[...]
2021-02-05
[167]
학술지
Jizyah and the State in India during the 17th Century
https://www.jstor.or[...]
[168]
서적
Ruka'at-i-Alamgiri; or, Letters of Aurungzebe, with historical and explanatory notes;
http://archive.org/d[...]
London : Luzac [etc., etc.]
1908
[169]
서적
Aurangzeb: The Life and Legacy of India's Most Controversial King
https://www.degruyt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7-01-01
[170]
서적
A History of Modern India: 1480–1950
Anthem Press
2002
[171]
서적
Between Scylla and Charybdis: The Jews in Sicily
Brill
[172]
서적
The Shiites of Lebanon under Ottoman Rule, 1516–1788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173]
백과사전
Jizya
Encyclopaedia of Islam
1960
[174]
학술지
the 1858 Tax Reform and the Other Nomads in Ottoman Asia
https://www.tandfonl[...]
2023
[175]
웹사이트
Gabars
http://concise.brita[...]
2007
[176]
서적
North African Jewry in the Twentieth Century: Jews of Morocco, Tunisia and Algeria
NYU Press
[177]
서적
Jewish Subjects and their Tribal Chieftains in Kurdistan: A Study in Survival
Brill
[178]
웹사이트
Sikhs pay Rs 20 million as 'tax' to Taliban
http://www.tribunein[...]
2009-04-16
[179]
웹사이트
The Islamic State Announces Caliphate
http://iswiraq.blogs[...]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014-07-01
[180]
서적
The challenge of political Islam non-Muslims and the Egyptian state
https://archive.org/[...]
Stanford University Press
[181]
서적
al-Dīn wa-al-siyāsah : taʼṣīl wa-radd shubuhāt
https://archive.org/[...]
European Council for Fatwa and Research
2007
[182]
서적
Islam in South Asia a short history
Brill
[183]
논문
Jizyah and the State in India during the 17th Century
[184]
서적
A history of modern India, 1480–1950
Anthem
[185]
논문
Holy Peace or Holy War: Tolerance and Co-existence in the Islamic Juridical Tradition
[186]
서적
Al-Jihād fī'l-Islām
https://archive.org/[...]
Dār al-Fikr
2005
[187]
서적
Religious pluralism and Isla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88]
서적
A history of the modern Middle East
Westview Press
[189]
서적
Arabs in History
https://archive.org/[...]
OUP Oxford
[190]
서적
A History of Islamic societe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
논문
The Poll Tax and the Decline of the Christian Presence in the Palestinian Countryside in the 17th Century
[192]
서적
Preaching of Islam: A History of the Propagation of the Muslim Faith
https://archive.org/[...]
Constable & Robinson Ltd
1913
[193]
웹사이트
Evidence on the Muslim Poll Tax from Non Muslim Sources
https://www.jstor.or[...]
[194]
서적
(일본어 출처로 추정)
[195]
문서
코란의 지즈야 언급 (9장 29절)
[196]
서적
統治の諸規則
[197]
웹사이트
税制 サウジアラビア - 中東 - 国・地域別に見る - ジェトロ
https://www.jetro.go[...]
2021-07-26
[198]
뉴스
「イスラム国」が殺害示唆、キリスト教徒脱出
https://web.archive.[...]
2014-07-19
[199]
서적
(일본어 출처로 추정)
[200]
서적
(일본어 출처로 추정)
[201]
서적
(일본어 출처로 추정)
[202]
서적
Minhadj
[203]
서적
Kitab al-Wagiz fi Fiqh Madhab al-Imam al-Safi’i
[204]
서적
Fetowa
[205]
서적
Un Traité maghrébin ‘Adversus Judaeos’. Ahkam ahl al-Dhimma
[206]
서적
Ja: mi ’al-Baya:n …
[207]
서적
[208]
사전
Dehkhoda Dictionary
[209]
서적
The Prophet and the Age of the Caliphates
[210]
서적
Islam the Straight Path
Oxford University Press
[211]
서적
(제목 없음)
1984
[212]
서적
The Holy Quran
King Fahd Holy Qur-an Printing Complex
1991
[213]
간행물
Poll Tax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