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진리는 논리학, 형이상학 등에서 논리적 공리 등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사고를 의미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을 진리론이라고 한다. 진리론에는 사유와 사물의 일치를 진리로 보는 진리대응설, 다른 명제와의 정합성을 진리로 보는 진리정합설, 실용적인 인식을 진리로 보는 진리 실용주의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불변의 사실을 뜻하는 제(諦)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힌두교에서는 '사티아'를 통해 진리를 정의하며, 한국 사회에서도 진실 보도, 사회적 갈등 해결 등 다양한 맥락에서 진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서양 철학에서 진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며 상대주의를 주장했다. 반면 플라톤은 현상 너머에 불변하는 이데아가 있다고 보았다(이데아론).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에 맞서 가장 확실한 진리를 찾고자 했으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진화론 등장 이후, 실용주의는 고정된 진리 대신 유용한 것이 진리라고 보았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서양 철학에서 진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며 진리의 상대주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현상 너머에 불변하는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이데아론을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찾기 위해 ‘사고하는 나’를 가장 확실한 진리로 제시하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2. 철학적 진리론
논리학과 형이상학에서 진리는 공리, 추론법칙, 구조 등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사고를 의미한다.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을 '''진리론'''이라고 하며, 수학, 철학, 언어학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리 논리학에서 구문론적으로는 정해진 추론규칙에 따라 올바르게 증명된 명제를 참이라고 하며, 의미론적으로는 정해진 논리적 구조 안에서 충족가능한(이치에 맞는) 명제를 참이라 한다. 괴델의 완전성 정리는 술어 논리에서는 이러한 양측의 진리론이 서로 일치한다는 내용의 정리이다.
진리론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8][9][10]
진리론은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으로, 신의 관점에서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나 근대 인식론의 성립으로 진리를 인간 지성 내부에서 찾는 주관주의가 등장했다. 과학의 발전에 따라 객관적인 과학적 진리 개념이 등장하면서 현대의 진리 개념은 다양하게 수정되었고, 잠정적인 진리라는 의미에서 상대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실재론과 결합된 새로운 진리대응설이 부활하고 있지만, 반실재론도 유력하며 논의는 수렴되지 않고 있다.
2. 1. 진리 대응설
대응설은 참인 신념과 진술이 실제 상황에 대응된다고 이해하는 진리론이다.[12]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기원을 둔 전통적인 모델이다.[13] 이 이론은 표상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이 "사물"을 정확하게 묘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물"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의해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대응 이론의 고전적인 예시는 13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Veritas est adaequatio rei et intellectusla" ("진리는 사물과 지성의 일치이다")라는 진술이다. 아퀴나스는 이 말을 9세기 신플라톤주의자 아이작 이스라엘리 벤 솔로몬에게 귀속시켰다.[14][15][16] 아퀴나스는 또한 "판단은 외부 현실에 부합할 때 참이라고 말한다"라고 다시 진술했다.[17]
대응 이론은 진실이 "객관적 현실"로 알려진 것을 정확하게 복제하고 이를 생각, 단어 및 기타 기호로 표현하는 문제라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18] 진리 대응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알프레트 타르스키 등이 있다.
2. 2. 진리 정합설
정합설에서 진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시스템 내에서 요소들이 적절하게 들어맞는 것을 요구한다. 정합성은 단순한 논리적 일관성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정합적인 시스템 내의 명제들이 서로에게 상호 추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21] 정합설의 만연한 원칙은 진리가 주로 명제의 전체 시스템의 속성이며, 개별 명제에는 전체와의 정합성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일부 변형된 정합설은 논리 및 수학의 형식 체계의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속성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22] 형식적인 추론자들은 공리적 독립성을 가진,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시스템들을 나란히 고려하는 것에 만족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있다. 전반적으로, 정합설은 다른 진리 영역, 특히 자연 환경, 일반적인 경험적 데이터, 심리학 및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주장에 적용하는 데 정당성이 부족하여 거부되어 왔다. 특히 다른 주요 진리 이론의 지원 없이 사용될 때 더욱 그러하다.[23]
정합설은 합리주의 철학자들, 특히 바뤼흐 스피노자,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 F. H. 브래들리의 사상을 구별한다.[24] 또한, 논리 실증주의의 여러 지지자들, 특히 오토 노이라트와 칼 헴펠 사이에서 부활을 찾았다.
2. 3. 진리 실용주의
찰스 샌더스 퍼스,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에 의해 20세기 초에 소개된 ''진리의 실용주의 이론''에 따르면, 진리는 개념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 효과에 의해 확인되는 ''품질''이며 가치를 갖는다.[25] 즉, 진리는 실용적인 결과를 낳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세기부터는 윌리엄 어니스트 호킹이 정의하고 명명한 "부정적 실용주의"라는 새로운 실용주의 이론도 등장했다. 이는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항상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29] 리처드 파인만도 "우리는 결코 확실히 옳을 수 없으며, 우리가 틀렸다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라며 이에 동의했다.[30]
2. 4. 진리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는 진리가 사회적 과정에 의해 구성되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수하며, 부분적으로는 한 공동체 내의 권력 투쟁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는 우리의 모든 지식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외부의 "초월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순수한 대응 이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진실에 대한 인식은 관습, 인간의 지각, 사회적 경험에 달려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8][9][10] 구성주의자들은 인종, 성, 성별을 포함한 물리적 및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믿는다.
잔바티스타 비코는 역사와 문화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였다. 비코의 인식론적 방향성은 "verum ipsum factum"—"진실 자체는 구성된다"라는 한 가지 공리로 전개된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진실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거나 구성될 수 있다는 전제에 대한 초기 지지자였다. 마르크스는 그 뒤를 이은 많은 비판적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진실의 존재를 거부하지 않고, 진정한 지식과 권력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해 왜곡된 지식을 구별했다. 마르크스에게 과학적이고 진정한 지식은 "역사의 변증법적 이해에 따른" 것이고 이데올로기적 지식은 "주어진 경제적 배치에서 물질적 힘의 관계에 대한 현상적인 표현"이다.[31]
특히 합의론(consensus theory)은 진리를 "합의된 모든 것"으로 정의한다.
2. 5. 진리 축소주의
논리학에서 진리 축소주의는 진리가 문장이나 명제의 실제 속성과 무관하다고 보는 접근이다. 잉여론과 수행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잉여론은 논리학의 발전 과정에서 진리 술어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2=4'는 참이다"라는 문장은 "2+2=4"와 논리적으로 동일하므로, "참이다"라는 진리 술어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8]
수행론은 "'A'가 참이다"라는 말은 "A"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발화 행위(speech act)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같다.[39] P. F. 스트로슨은 "'눈은 희다'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이 희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랭크 램지는 프레게의 논의를 발전시켜 진리는 불필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명제 P는 명제 '명제 P는 참이다'와 동치이므로, 진리 술어는 어떤 성질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6. 진리 다원주의
믿음이나 진술을 참으로 만드는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40] 예를 들어 윤리적 명제는 그것이 속한 체계와의 일관성 덕분에 참일 수 있으며, 물리적 세계에 대한 명제는 대상이나 속성과의 대응에 의해 참일 수 있다.[40]
찰스 샌더스 퍼스와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과 같은 일부 실용주의 이론은 대응, 일관성 및 구성주의 이론의 측면을 포함한다.[26][27] 크리스핀 라이트는 1992년 저서 『진실과 객관성』에서 진리에 대한 특정 상투성을 충족하는 모든 술어가 진리 술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일부 담론에서 진리 술어의 역할이 초주장 가능성의 개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45] 마이클 린치는 2009년 저서 『하나이자 많은 진실』에서 진실을 대응이나 일관성과 같은 별개의 속성으로 다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46]
2. 7. 기타 진리론
3. 진리 개념의 역사적 변천
진화론의 등장으로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미국에서는 유용한 것이 진리라는 실용주의가 나타났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영어 단어 ‘truth’는 고대 영어 tríewþ, tréowþ, trýwþang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고대 노르드어 tryggðnon와 관련이 있다. "truth"는 "성실함, 충실함, 충성심, 진실성, 정직성"뿐만 아니라 "사실 또는 현실과의 일치"라는 의미도 포함한다.[7]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주요 이론으로는 대응설, 정합설, 실용주의, 축소주의, 인식론적 이론 등이 있다.[8][9][10] 2009년 조사에 따르면 철학자들의 45%가 대응설을 지지했고, 21%가 축소주의를, 14%가 인식론적 이론을 지지했다.[11]
P. F. 스트로슨은 "'눈은 희다'가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눈이 희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39]
철학적 회의주의는 지식이나 믿음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다.[41][42] 급진적 회의주의는 지식이나 합리적 믿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온건한 회의주의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회의주의는 종교적 원리에 대한 의심이며, 과학적 회의주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믿음의 신뢰성을 검증한다.[44]
마르틴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에서 진리의 본래적 의미가 미(未)은폐, 즉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보았다.[97][98] 그는 이 개념이 라틴어 veritasla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하이데거는 진리가 존재 자체에 내재한다고 여겼으며,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진리"와 동일시했다.[99]
장-폴 사르트는 마르틴 하이데거를 따라 진리를 존재 그 자체와 대자 존재 사이의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모든 진리가 자아 의식에 의해 ''이해''되는 것으로 보았다.[100] 사르트르는 방법의 탐구에서 진리를 "총체화"하는 "역사의 진실"로 묘사했다.[103][104]
알베르 카뮈는 "진실은 있지만 진리는 없다"고 썼으며, 이는 니체의 관점주의와 일치한다.[106]
앨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완전한 진실은 없다. 모든 진실은 반쪽 진실이다."라고 말했다.[109]
니시다 기타로는 "세상 사물에 대한 지식은 통일된 의식의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분화로 시작되어 자아와 사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고 보았다.[111]
에리히 프롬은 "절대적 진리"는 무의미하며 "최적의 진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진리가 현실에 대한 기능적인 근사치라고 보았다.
미셸 푸코는 진실을 "진실의 레짐"으로 보았으며, 이는 주어진 권력 구조에 내재된 것이다. 그의 견해는 니체와 유사하다.[112]
장 보드리야르는 진실을 시뮬라크르로 간주했으며, 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은폐하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114][115]
3. 1. 고대 그리스 철학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하며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주장했다.[119] 프로타고라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지므로, 바람 자체가 따뜻한지 차가운지에 대한 답은 없다.[119] 즉, 판단 기준은 개인이며,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없고 각자의 생각이 진리가 된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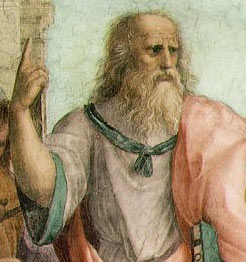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를 비판하며, 지식은 항상 존재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프로타고라스가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라고 고집하면 자신의 생각이 거짓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파르메니데스의 불생불멸 사상과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유전 사상을 종합하여, 현실 세계는 가상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지만, 이데아의 세계는 진실로 존재하며 영원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에서는 가설을 세우고 연역되는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면 현상계의 진리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일관성이 깨지면 가설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여, 명제 간 조화를 기준으로 하는 정합설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처럼 진리를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이데아가 개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비판하고, 진리 대응설을 전개했다. 그는 형이상학에서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며,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정의했다.[70] 즉, 진리는 사유와 실재의 일치로 정의되며, 진리론, 인식론, 존재론이 로고스 안에서 불가분적으로 연결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을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았고, 학문을 이론, 실천, 제작으로 나누었다. 그는 사원인설을 제시하여 모든 현상에는 형상인, 질료인, 동력인, 목적인의 네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존재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생성되며, 모든 현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의 동자인 "신"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크세노파네스, 데모크리토스, 피론 등은 진리가 인간에게 접근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초기 철학적 회의주의를 형성했다. 피론은 진리의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감각적 지각이 참이며 오류는 판단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고, 스토아 학파는 진리가 판타시아를 통한 인지적 파악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믿었다.
3. 2. 중세 철학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회의주의에 휩싸였으나, 이후 신학자로서 "종교적 진리"를 탐구하였다. 그는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적인 명제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고, 신과 영혼을 인식하고자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수정하여, 세계는 로고스(진리)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보았다(진리의 존재론적 측면).[120] 요한복음에 따르면 모든 것은 로고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인간 역시 이 세계의 피조물 중 하나이며, 그 영혼은 진리와 연결되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진리의 인식론적 측면). 영혼은 "나"라는 의지이며, 자율적인 실체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 탐구하며, 이 사랑은 만물의 근원인 신을 향한다. 신은 인식의 원리이자 진리이며, 인간은 감각이 아닌 이성(내적 인간)을 통해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이성은 인간만이 가진 신적인 요소이다. 이성은 내부를 향하며, 초월적인 지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다(진리의 행복론적 측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진리론은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수정하여, 데카르트의 회의론 극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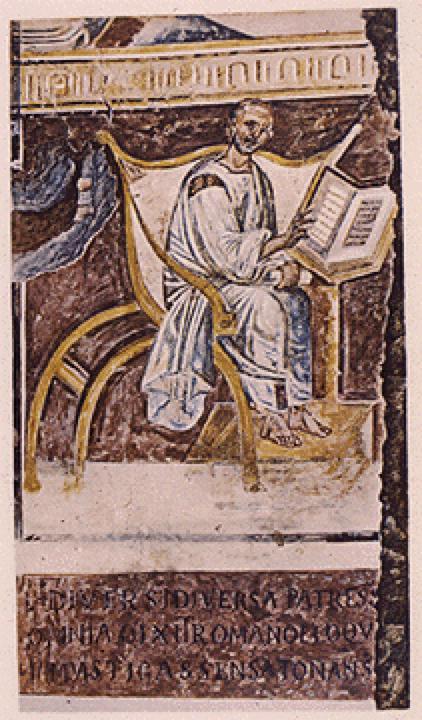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로고스 중심 인식론 및 존재론과 기독교 신학을 통합하여 진리론을 제시했다. 그는 진리를 사유와 사물의 일치로 정의하며 대응설을 주장했다. 아퀴나스는 십자군 이후 아랍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그리스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응해야 했다.[120] 그는 아비켄나, 아베로에스 등 이슬람 철학자들과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대결했다. 또한 아비케브론을 비롯한 유대인 사상가들과도 대결했는데, 이는 회의주의보다는 독단주의와의 대결이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론을 계승하면서도 기독교 신학과의 조화를 위해 수정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 개념을 받아들였지만, 구약성서의 출애굽기 3장 14절("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을 근거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에 "존재-본질"(esse-essentia) 개념을 추가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적 세계관(신과 제1질료)과 달리, 세계는 신에 의해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영혼은 불멸하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지만(우주론적 증명),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의 본질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다. 인간은 신의 "은총의 빛"과 "영광의 빛"을 통해 지성이 성장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총의 빛만 받으므로 믿음, 사랑, 희망의 인도가 필요하다. 죽음 이후에야 "영광의 빛"을 받아 신의 본질을 완전히 인식하고 참된 행복을 얻는다.
3. 3. 근대 철학

르네 데카르트는 수학·기하학 연구를 통해 얻은 개념은 의심할 수 없는 명증적인 것이며, 이성은 영원한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한 진리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며(영원 진리 창조설),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았다. 그는 수학적인 영원한 진리조차도 일단 의심한다는 방법적 회의론을 주장했고, 결국 육체를 포함한 모든 외적 사물이 회의에 걸린 후에,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화된 정신만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거기에서 그는 정화된 정신에 명석하고 판명하게 나타나는 것만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진리 명증설을 제창했다.[121]
이처럼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근대적 인식론의 성립으로 존재론과 진리론이 일단 분리되어 인식론과 진리론이 직결되었고, 진리를 인간 지성의 내부에서 찾는 주관주의가 성립했다.
데카르트의 명증설은 이후 이마누엘 칸트의 초월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에드문트 후설이 취하게 된다. 후설은 수학 기초론 연구를 시작으로 사상 그 자체로 되돌아가는 현상학을 창시했지만,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수학이 그의 철학적 출발점이 되었다. 후설이 명증성의 기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소위 《위기서》에 따르면 그것은 생활 세계가 될 것이다. 사상에 반복적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생활 세계의 무한한 개정 가능성이야말로 후설이 제시한 진리이다.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대륙 합리론에 서 있는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명증이라는 심리적인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반대하여, 모든 진리는 선험적인 분석 명제이며,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동일률로 환원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진리의 기준을 무모순성이라는 논리적인 것에 두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의 논리학을 중시하는 학문 체계가 중기 플라톤의 정합설과 결합되었다.
정합설은 존재자를 문제 삼지 않고, 명증성 또는 논리적 정합성은 차치하고 인간의 지성 내의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관주의이다. 하지만, 정합설은 복수의 정합적인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플라톤이 창시한 아카데미아에서 회의주의가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대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헤겔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개념을 뒤집어, 진리는 변증법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며, 모순은 진리의 대립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발전 원인이며, 그 발전 운동의 정합적인 전체야말로 진리라고 했다. 헤겔의 정합설은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인식론을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존재론을 포함하고 있다. 칸트는 주관/객관의 이항 대립 도식을 전제로 하면서, 현상과 물자체를 엄밀히 구분했지만, 헤겔은 변증법에 의해 현상의 배후에 있는 물자체에 절대 정신이 도달하는 것을 인정했다. 헤겔의 진리론은 모순을 포함한 인간의 삶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까지 이성에 의해 일원화하는 것이었다.
이마누엘 칸트는 진리 대응 이론에 따른 진리 정의를 지지한다.[70]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진리에 대한 명목적 정의, 즉 지각이 대상과 일치한다는 것은 여기서 인정되고 전제된다"라고 말했다.[82] 그는 이러한 진리 대응 정의가 어떤 판단이 참인지 확립할 수 있는 시험이나 기준을 제공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는 논리학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83]
> 진리는 지각이 대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 단순한 명목적 정의의 결과로, 나의 지각은 참으로 간주되기 위해 그 대상과 일치해야 한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나는 그 대상을 '인지함으로써만' 나의 지각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의 지각은 스스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리에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대상은 나 밖에 있고, 지각은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대상에 대한 나의 지각이 대상에 대한 나의 지각과 일치하는지 여부뿐이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그러한 설명을 순환 논법, 즉 ''diallelon''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실제로 논리학자들은 이 진리 정의를 가지고 누군가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증인에게 호소하지만, 그 증인이 자신을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신뢰성을 확립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 회의론자들에게 항상 이 오류로 비난을 받았다. 그 비난 역시 근거가 있었다. 단, 지적된 문제의 해결은 자격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하다.
이 구절은 칸트의 명목적 정의와 실제적 정의 사이의 구분을 활용한다. 명목적 정의는 언어 표현의 의미를 설명한다. 실제적 정의는 특정 대상의 본질을 설명하고 주어진 항목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84] 칸트는 진리의 정의가 단지 명목적일 뿐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어떤 판단이 참인지 확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칸트에 따르면 고대 회의론자들은 단지 명목적 정의를 통해 어떤 판단이 참인지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논리학자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자격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1]
3. 4. 현대 철학
니체는 진리 탐구를 철학자들의 ''권력 의지''의 결과로 보았다. 그는 진리가 삶과 권력 의지를 증진시키는 한 사용되어야 하며, 삶의 향상을 가져온다면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보다 낫다고 생각했다.[89] 그는 "어떤 판단의 거짓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반대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판단이 어느 정도까지 삶을 증진시키고, 보존하며, 종을 보존하고, 심지어 종을 번식시키느냐이다..."라고 썼다.[89] 니체는 객관적 진리의 개념에 도전하며, 진리는 인간의 창조물이며 실용적인 목적에 봉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이란 그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환상이다."라고 썼다.[92]
윌리엄 제임스는 실용주의를 통해 유약형 정신과 강인형 정신을 매개하는 사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실용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이 가져오는 행동이 전부라고 말하며, 사상을 자연을 개변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고, 사상이 생존에 필요한 실리에 부합한다면 그것이 진리이며, 진리의 역할은 현실에 사고를 방향 짓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찰스 샌더스 퍼스는 진리의 기준을 연구자 집단에서의 연구자들의 의견 일치에 두었다. 위르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전회를 통해 토론에서의 합의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다. 퍼스와 하버마스는 기초주의를 비판하고, 가오류주의를 취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진리의 본래적 의미가 미(未)은폐, 즉 이전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열린 상태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았다.[97][98] 그는 진리가 존재 자체에 내재한다고 여겼으며, 존재와 시간에서 진리를 "존재-진리" 또는 "존재의 진리"와 동일시했다.[99]
미셸 푸코는 "객관적" 특성으로 진실을 보려는 시도가 있을 때 진실은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이라는 용어 대신 "진실의 레짐"을 선호했다. 그는 진실이 주어진 권력 구조의 일부이거나 그 안에 내재된 무언가라고 보았다. 푸코의 견해는 니체의 개념과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112]
장 보드리야르는 진실을 대체로 시뮬레이션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시뮬라크르는 결코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은폐하는 진실이라고 주장했다.[114][115]
4. 종교에서의 진리
각 종교는 진리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제(諦)'라고 부르며,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진실한 도리를 뜻한다. 4성제(고제, 집제, 멸제, 도제)와 연기법, 중도(中道), 일체유심(一切唯心) 등을 진리로 본다. 이제설에 따라 상대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진리를 구원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힌두교에서는 진리를 "불변의 것", "왜곡이 없는 것" 등으로 정의하며, "사티아메바 자야테"(진실만이 승리한다)와 같은 격언을 통해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1. 불교
불교에서 진리는 전통적인 불교 용어로 제(諦)라고 하는데, 진실한 도리(道理) 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事實)을 뜻한다. 《대승광오온론》 등에 따르면 4성제(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한다.[1]또한, 연기법, 중도(中道), 일체유심(一切唯心) 같은 것을 말한다.
불교, 특히 대승 불교에서는 진리라는 개념을 이제설에 따라 상대적 또는 관습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로 구분한다. 전자는 일반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인 이해에 기반한 진리를 말하며, 더 높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기반으로 받아들여진다. 궁극적 진리는 일반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논리를 초월하며, 그러한 현상을 환상으로 인식한다. 중관 학파 철학은 모든 교리가 진리의 두 가지 구분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긍정과 부정은 각각 상대적 진리와 절대적 진리에 속한다. 정치법은 상대적 진리로, 종교법은 절대적 진리로 간주된다.
4. 2. 기독교

기독교는 진리에 대한 구원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6에 따르면,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4. 3. 힌두교
힌두교에서 진리는 "불변의 것", "왜곡이 없는 것", "시간, 공간, 사람의 구분을 초월한 것", "모든 변함없는 상태로 우주를 관통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므로 완전히 참된 것은 아니다. 힌두교 현자들은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참고 사항, 속성 및 설명을 제시했다.- 인도의 국가 모토: "사티아메바 자야테"(진실만이 승리한다)
- "사티암 묵타예"(진실이 해방된다)
- "사티아는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말과 마음을 자비롭게 사용하는 것이며, 즉 책임 또한 진실이다"
- "진실을 말하는 데 확고히 정립되면 행동의 결과는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 수트라 번호 2.36)
- "진실의 얼굴은 황금 그릇으로 덮여 있다. 오, 푸산(태양)이여, 덮개를 벗겨라. 그러면 진실을 나의 의무(사티아 다르마)로 하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라!" (브리하다라냐카 V 15 1–4 및 간단한 II사 우파니샤드 15–18)
- 진실은 침묵보다 우월하다 (마누스므리티)
다른 단어와 결합된 사티아는 "울트라" 또는 "최고"와 같은 수식어로 작용하며, "가장 참된"으로 "순수함과 탁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티알로카는 "최고의 천국"이며 사티야 유가는 힌두교의 4개의 주기적 우주 시대 중 "황금 시대" 또는 최고 시대를 의미한다.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인 부처는 "세 가지는 오랫동안 숨길 수 없다. 태양, 달, 그리고 진실이다."라고 말했다.
5. 한국의 관점에서의 진리
한국 사회는 '진리'라는 개념을 객관적인 사실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 역사적 진실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진실 규명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알프레드 타르스키는 형식 언어를 통해 진리 술어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고, 칼 포퍼는 과학적 실재론과 타르스키의 진리 의미론을 결합하여, 반증 가능성을 통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는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하위 섹션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간략하게 수정)
5.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참조
[1]
웹사이트
truth
http://m-w.com/dicti[...]
Merriam-Webster's Online Dictionary
2005
[2]
웹사이트
Truth
https://plato.stanfo[...]
2020-06-29
[3]
서적
Truth
http://press.prince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10-04
[4]
문서
see [[Holtzmann's law]] for the ''-ww-'' : ''-gg-'' alternation.
[5]
웹사이트
Online Etymology
http://www.etymonlin[...]
2013-11-27
[6]
웹사이트
A Concise Dictionary of Old Icelandic
http://www.northvegr[...]
Geir T. Zoëga
1910
[7]
문서
"OED on ''true'' has Steadfast in adherence to a commander or friend, to a principle or cause, to one's promises, faith, etc.; firm in allegiance; faithful, loyal, constant, trusty; honest, honourable, upright, virtuous, trustworthy; free from deceit, sincere, truthful besides Conformity with fact; agreement with reality; accuracy, correctness, verity; Consistent with fact; agreeing with the reality; representing the thing as it is; real, genuine; rightly answering to the description; properly so called; not counterfeit, spurious, or imaginary."
[8]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96
[9]
서적
Tru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0]
서적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Blackwell
1997
[11]
웹사이트
The PhilPapers Surveys – Preliminary Survey results
http://philpapers.or[...]
Philpapers.org
2012-05-27
[12]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13]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14]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15]
웹사이트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http://plato.stanfor[...]
[16]
문서
Summa Theologiae
[17]
웹사이트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http://plato.stanfor[...]
[18]
문서
See, e.g., Bradley, F.H., "On Truth and Copying", in Blackburn, et al. (eds., 1999),Truth, 31–45.
[19]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20]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21]
문서
[[Immanuel Kant]], for instance, assembled a controversial but quite coherent system in the early 19th century, whose validity and usefulness continues to be debated even today. Similarly, the systems of [[Gottfried Wilhelm Leibniz|Leibniz]] and [[Spinoza]] are characteristic systems that are internally coherent but controversial in terms of their utility and validity.
[22]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23]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24]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25]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26]
문서
Peirce, C.S. (1901), "Truth and Falsity and Error" (in part), pp. 716–720 in [[James Mark Baldwin]], ed., Dictionary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v. 2. Peirce's section is entitled "Logical", beginning on p. 718, column 1, and ending on p. 720 with the initials "(C.S.P.)", see Google Books [https://archive.org/details/beginningthirdr00randgoog/page/n748 Eprint]. Reprinted, [[Charles Sanders Peirce bibliography#CP|Collected Papers]] v. 5, pp. 565–573.
[27]
서적
The Meaning of Truth, A Sequel to 'Pragmatism'
1909
[28]
간행물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9
[29]
서적
Ideas of the Great Philosophers
Barnes & Noble
1966
[30]
서적
The Character of Physical Law
Modern Library
1994
[31]
서적
Between Genealogy and Epistemology: Psychology, Politics, and Knowledge in the Thought of Michel Foucaul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3
[32]
문서
See, e.g., Habermas, Jürgen,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English translation, 1972).
[33]
문서
See, e.g., Habermas, Jürgen,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English translation, 1972), esp. Part III, pp. 187 ff.
[34]
서적
Pluralism: Against the Demand for Consensus
1995
[35]
서적
Truth
1999
[36]
서적
Theories of Truth: A Critical Introduction
MIT Press
1992
[37]
논문
Facts and Propositions
1927
[38]
간행물
Ramsey on Truth and Truth on Ramsey
2004
[39]
서적
How to Do Things With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40]
문서
Performative Theory of Truth
Macmillan
1969
[41]
웹사이트
skepticism
https://encyclopedia[...]
n.d.
[42]
웹사이트
Philosophical views are typically classed as skeptical when they involve advancing some degree of doubt regarding claims that are elsewhere taken for granted.
http://www.utm.edu/r[...]
2009-01-13
[43]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Skepticism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US
[44]
웹사이트
Definition of SKEPTICISM
http://www.merriam-w[...]
2016-02-05
[45]
문서
Truth and Objectiv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46]
문서
Truth as One and Ma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7]
문서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48]
서적
William of Sherwood's Treatise on Syncategorematic Word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49]
서적
Many-Valued Logics
Routledge
2018-05-25
[50]
서적
The Development of Modern Logic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51]
웹사이트
A Brief History of Fuzzy Logic
https://www.edusoft.[...]
Revista EduSoft
2018-05-25
[52]
서적
Topics in Philosophical Logic
Humanities Press Synthese Library volume 17
[53]
서적
Realism in Mathe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US
1992
[54]
서적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Logic
Chapman and Hall/CRC
2009-08-11
[55]
문서
The Limits of Mathematics
1997
[56]
논문
Hilbert's Tenth Problem is Unsolvable.
1973
[57]
서적
The Honors Class. Hilbert's Problems and Their Solvers
2002
[58]
문서
The Limits of Mathematics
1997
[59]
웹사이트
On Gödel's Philosophy of Mathematics
http://www.friesian.[...]
2018-05-25
[60]
웹사이트
On Kurt Gödel's Philosophy of Mathematics
http://calculemus.or[...]
2018-05-25
[61]
서적
A Logical Journey: From Gödel to Philosophy
https://books.google[...]
The MIT Press
[62]
논문
Outline of a Theory of Truth
1975
[63]
서적
Universality and the Liar: An Essay on Truth and the Diagonal Arg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64]
서적
Topoi, the categorial analysis of logic
Sole distributors for the U.S.A. and Canada, Elsevier North-Holland
1983
[65]
서적
Replacing truth
Oxford Univ. Press
2013
[66]
웹사이트
truth {{!}} philosophy and logic
https://www.britanni[...]
2017-07-28
[67]
논문
Meta‐analysis of theory‐of‐mind development: the truth about false belief.
2001
[68]
논문
Alethic functionalism and our folk theory of truth.
2005
[69]
논문
Logical non-apriorism and the law of non-contradiction.
2004
[70]
웹사이트
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http://plato.stanfor[...]
2005
[71]
서적
The Cambridge Companion to Epicureanism
https://archive.org/[...]
Cambridge University Press
[72]
서적
Epicurean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3]
간행물
Influence of Muslim Philosophy on the West
[74]
서적
Nature and Creature: Thomas Aquinas's Way of Thought
Brill
[75]
서적
Liber de philosophia prima, sive Scientia divina
[76]
서적
Avicenna: The Metaphysics of The Healing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77]
문서
'Disputed Questions on Truth, 1, 2, c, reply to Obj. 1. Trans. Mulligan, McGlynn, Schmidt, Truth, vol. I, pp. 10–12.'
[78]
문서
'"Veritas supra ens fundatur" (Truth is founded on being). Disputed Questions on Truth, 10, 2, reply to Obj. 3.'
[79]
논문
Forsworn and Fordone: Arcite as Oath-Breaker in the "Knight's Tale"
[80]
논문
Medieval Literature and Historical Enquiry
[81]
논문
'Rev. of Green, A Crisis of Truth'
[82]
서적
Critique of Pure Rea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83]
서적
The Jäsche Log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84]
간행물
Kant on the Nominal Definition of Truth
[85]
문서
"Die Wahrheit ist die Bewegung ihrer an ihr selbst." The Phenomenology of Spirit, Preface, ¶ 48
[86]
문서
'On the Fourfold Root of 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 29–33'
[87]
서적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Princeton University Press
[88]
서적
Kierkegaard
Oneworld Publications
[89]
웹사이트
"Friedrich Nietzsche – Early Writings: 1872–1876"
http://plato.stanfor[...]
2018-09-04
[90]
서적
Nietzsche: The Gay Science: With a Prelude in German Rhymes and an Appendix of Songs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1]
서적
Nietzsche: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and Other Writings Student Editio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92]
서적
Beyond Good and Evil
Dover Publications
[93]
서적
The Portable Nietzsche
https://books.google[...]
Penguin Books
[94]
서적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95]
서적
Thus Spoke Zarathustra
https://books.google[...]
Penguin UK
[96]
서적
Thus Spoke Zarathustra
https://books.google[...]
Penguin UK
[97]
웹사이트
On the Essence of Truth
https://aphelis.net/[...]
2023-10-03
[98]
웹사이트
Martin Heidegger on Aletheia (Truth) as Unconcealment
http://www.ontology.[...]
2010-08-13
[99]
서적
Being and Time
Basil Blackswell
[100]
서적
Being and Nothingness: An Essay on Phenomenological Ontolgoy
Philosophical Library
[101]
서적
The imaginary: a phenomenological psychology of the imagination
Routledge
2004
[102]
논문
Truth and existence: The idealism in Sartre's theory of truth
[103]
서적
Search for a Method
Knopf
[104]
서적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04-28
[105]
서적
Critique of Dialectical Reason
Verso
[106]
서적
The Myth of Sisyphus and Other Essays
Penguin Group
[107]
서적
The Rebel
Penguin Group
[108]
서적
The Rebel
Penguin Group
[109]
문서
Dialogues
[110]
웹사이트
How to Make Our Ideas Clear
http://www.peirce.or[...]
2015-08-31
[111]
웹사이트
Nishida Kitarô – Self-Awareness
http://plato.stanfor[...]
[112]
서적
The Order of Things
Vintage Books
[113]
서적
Simulacra and Simulation
Michigan University Press
[114]
웹사이트
Simulacra and Simulations
http://www.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15]
논문
Lights, Camera, Action: Baudrillard and the Performance of Representations
https://www.ubishops[...]
2005-01
[116]
웹사이트
Truthmaker Theory
https://iep.utm.edu/[...]
2020-11-28
[117]
서적
Truthmakers: The Contemporary Debate
https://philpapers.o[...]
Clarendon Press
2020-11-28
[118]
백과사전
真理
http://100.yahoo.co.[...]
[119]
서적
生き方について哲学は何が言えるか
産業図書
[120]
문서
[121]
백과사전
真理
http://100.yahoo.co.[...]
[122]
서적
虚無の構造
中央公論新社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