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성호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십자 성호는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한 형태로, 2세기부터 시작되어 4세기부터 예식에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이마에만 십자가를 그렸으나, 이후 이마, 가슴, 어깨 순으로 십자가를 긋는 형태로 발전했다. 현재 천주교, 성공회, 루터교 등 일부 교파에서는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으로 긋고, 동방 정교회는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으로 긋는다. 십자 성호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기억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파에 따라 손가락 모양과 긋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
십자성호는 기독교의 보편교회 시절인 2세기 이후부터 신자들이 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4세기경부터는 공적인 예식에도 활용되었다.[59] 초기에는 주로 이마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방식이었으나 점차 발전하였다.
기독교의 십자성호는 보편교회 시절인 2세기 이후부터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엄지나 집게손가락으로 이마에 작게 십자가를 그리는 형태였다.[59] 4세기경부터는 예전, 즉 공인된 기독교 의식에서도 이마와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59]
2. 역사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 동방과 서방 교회의 십자성호 긋는 방식에 차이가 생겼다. 동방 교회는 전통적인 순서(이마-가슴-오른쪽 어깨-왼쪽 어깨)를 유지한 반면, 서방 교회는 13세기 무렵 현재와 같은 순서(이마-가슴-왼쪽 어깨-오른쪽 어깨)로 변경하였다.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성호경을 함께 외운다.
2. 1. 초기 기독교
십자성호는 기독교의 보편교회 시기인 2세기 무렵부터 행해진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엄지나 집게손가락으로 이마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형태였다.[59][5] 로마 제국의 카르타고(현재의 튀니지) 지역에서는 200년경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 성호로 이마를 닳게 한다"고 기록할 정도로 널리 행해졌다.[7] 다른 지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손 전체나 두 손가락을 사용하기도 했다.[6]
3세기 초 로마의 히폴리토스는 그의 저서 《사도 전승》에서 유혹을 받을 때 이마에 십자 성호를 그으라고 권하며, 이를 "수난의 표징"이라고 불렀다.[5] 4세기경부터는 예배와 같은 공적인 예식에서도 이마나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전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59]
4세기의 교부 예루살렘의 키릴로스(315–386)[15]는 십자 성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십자 성호가 악마를 물리치는 힘이 있으며[16],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표현이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상생활(식사, 출입, 잠자리 등)에서 항상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키릴로스는 십자가를 "신실한 자들의 표징이며, 악마들의 두려움"이자 "훌륭한 보존 수단"으로 묘사했다.[16]
후대의 교부인 다마스쿠스의 요한(650–750)[17] 역시 십자가 형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십자가 형상 자체(나무 등)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이며, 마태오 복음서 24장 30절[18]에 언급된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18]
이러한 초기 형태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의 미사 중 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신자들이 이마, 입술, 가슴에 차례로 작은 십자가를 긋는 행위(작은 십자 성호)가 그것이다.[5] 또한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재로 십자를 받는 것이나, 동방 정교회에서 병자성사 등에서 이마에 성유를 바르는 것 역시 초기 관습과 연결된다.[5]
2. 2. 동서 교회 분열 이전
성호는 보편교회 시절인 2세기 이후부터 실행된 것으로 본다.[59]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엄지나 집게 손가락으로 이마에만 작게 십자가를 그리는 형태였다.[59] 4세기 경부터는 예전(기독교에서 성경과 전통에 근거하여 공인한 의식)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이 시기에는 이마와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전통이 생겨났다.[59]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전, 보편교회 시기의 십자성호는 일반적으로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로 그었다. 이 순서는 이후 동방 교회에서 계속 유지되었다.
2. 3. 동서 교회 분열 이후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에도 동방 교회는 보편교회 시기부터 이어져 온 십자성호 순서, 즉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반면, 서방 교회에서는 13세기 무렵에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으로 긋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현재 서방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천주교회와 개신교 일부 교파(성공회, 루터교 등)는 변경된 순서인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으로 성호를 긋는다. 동방 교회(동방정교회, 동방천주교회 등)는 전통적인 방식인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를 따른다.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일반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성호경을 외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신앙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십자성호는 2세기부터 개인적인 기도에서 엄지나 집게손가락으로 이마에 작게 긋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4세기부터는 기독교의 공인된 의식인 예전에서도 이마와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전통이 생겨났으며, 현재 서방교회 형태의 십자성호는 13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세 손가락을 모아서 사용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손 전체를 펴서 사용하기도 한다.[59]
3. 교파별 십자 성호
보편교회 시기의 십자성호는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로 그었다.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에도 동방 교회(동방정교회, 동방 가톨릭 교회 등)는 이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서방 교회(천주교회와 개신교 일부 교파인 성공회, 루터교 등)는 13세기 즈음부터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59] 과거 서방 교회에서도 동방 정교회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호를 그렸으나[8], 현재 라틴 교회(서방 가톨릭)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다만 동방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는다.[9]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성호경을 외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신앙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손 모양은 교파별로 차이가 있다. 동방 정교회와 비잔틴 전례의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첫 세 손가락(엄지, 검지, 중지) 끝을 모으고 나머지 두 손가락(약지, 소지)은 손바닥에 댄다. 모은 세 손가락은 삼위일체를, 나머지 두 손가락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나타낸다.[10]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에서도 첫 세 손가락을 모으고 나머지 두 손가락을 손바닥에 대며, 이마, 가슴 아래, 왼쪽, 오른쪽 순서로 터치한 뒤 고개를 숙이고 가슴에 펴진 손을 얹는다.[50][51] 서방 교회의 경우, 과거에는 삼위일체를 뜻하는 세 손가락을 모아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대에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 없이 손 전체를 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59]
3. 1. 천주교회
천주교회를 포함한 서방 교회에서는 13세기 경부터 십자성호를 긋는 순서가 현재와 같이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으로 변경되었다.[59] 이는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전 보편교회 시기 및 현재의 동방정교회 방식(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과 차이가 있다. 성공회, 루터교 등 일부 개신교 교파에서도 서방 교회와 같은 순서로 십자성호를 긋는다.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성호경을 외우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21]
역사적으로 십자성호는 2세기경 개인적인 기도 시 엄지나 집게손가락으로 이마에 작게 십자가를 그리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4세기부터는 기독교의 공인된 의식인 예전에서도 이마와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전통이 생겨났으며, 현재와 같은 형태의 십자성호는 13세기에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59] 과거 서방 교회에서도 동방 정교회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성호를 그렸으나[8], 현재 라틴 교회(서방 가톨릭)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다만 동방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는다.[9]
손가락 모양에 대해서 천주교회는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으나,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세 손가락(엄지, 검지, 중지)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나머지 두 손가락(약지, 소지)을 손바닥에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10][59]
천주교회에서 십자성호는 교회가 "성사(聖事)와 유사한 거룩한 표징"으로 정의하는 준성사에 해당한다. 이는 "교회의 중재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표징으로 여겨지며, 기도와 함께 손 얹기, 십자성호, 성수 뿌리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20] 가톨릭교회 교리서(CCC) 1670항에 따르면, 준성사는 성사처럼 직접 은총을 주지는 않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신자들이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에 협력하도록 돕는다. 신심 깊은 신자들에게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신적 은총으로 삶의 거의 모든 사건을 거룩하게 한다고 설명한다.[20] 또한 CCC 1671항은 준성사 중 축복이 가장 중요하며, 모든 축복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선물을 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베풀고, 이때 보통 십자성호를 긋는다.[20] CCC 2157항은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활동할 때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루를 하느님의 영광에 바치고 구세주의 은총을 청한다고 가르친다. 십자성호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신자들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진다.[21] 성 요한 비안네는 진정으로 긋는 십자성호가 "모든 지옥을 떨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22]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서는 입당 성가가 끝난 후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십자성호를 긋는다. 또한 사제나 부제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책과 자신의 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성호를 긋는다.[23] 신자들은 미사 시작 인사와 마지막 축복 때 십자성호를 긋는 것이 권장되며, 선택적으로 성수 축복을 받을 때, 참회 예식을 마칠 때, 복음 봉독 전에 사제를 따라 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성호를 그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신심에 따라 다른 경우에도 십자성호를 그을 수 있다.
성당에 들어갈 때 신자들은 입구에 놓인 성수에 손가락을 적셔 십자성호를 긋기도 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등 수시로 십자성호를 긋는다.
주교나 사제가 신자들을 축복할 때에도 십자성호를 긋는데, 이때는 오른손을 펴서 올린 상태에서 주교나 사제 자신의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순서로 허공에 십자를 그린다. 이 축복 시의 좌우 순서는 동방 정교회와 동일하다.
3. 2. 동방 정교회
보편교회 시절부터 이어진 십자성호는 4세기경부터 예식에 활용되었다. 동방 정교회는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에도 보편교회 시기의 방식인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서방 교회가 13세기 즈음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순서를 변경한 것과 차이가 있다.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성호경을 외는데,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신앙고백이다.
동방 정교회와 비잔틴 전례의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십자성호를 그릴 때 오른손의 세 손가락(엄지, 검지, 중지) 끝을 모으고 나머지 두 손가락(약지, 소지)은 손바닥에 댄다. 모은 세 손가락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손바닥에 댄 두 손가락은 예수의 두 가지 본성, 즉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나타낸다.[10] 십자성호를 그을 때는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겨드랑이를 가능한 한 조이고 긋는다. 대부분 긋기를 마친 후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서방 교회보다 예배 중에 십자성호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며,[24] 정해진 전례 시점 외에도 신자들은 자유롭게 십자성호를 그을 수 있다.[24][25][26] 사적 기도와 공적 기도 모두에서 십자성호를 행하며, 성당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 십자가, 복음서, 이콘, 성유물 등에 경배하고 입맞춤할 때(입맞춤 전 두 번, 후 한 번), 성경을 봉독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인이나 테오토코스(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부를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십자성호를 긋는다. 성령 임재 기도 중에는 사제가 빵 위에 십자성호를 긋기도 한다.[27] 초기 신학자 카이사레아의 바실은 예비 신자의 입회식에서 십자성호를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28]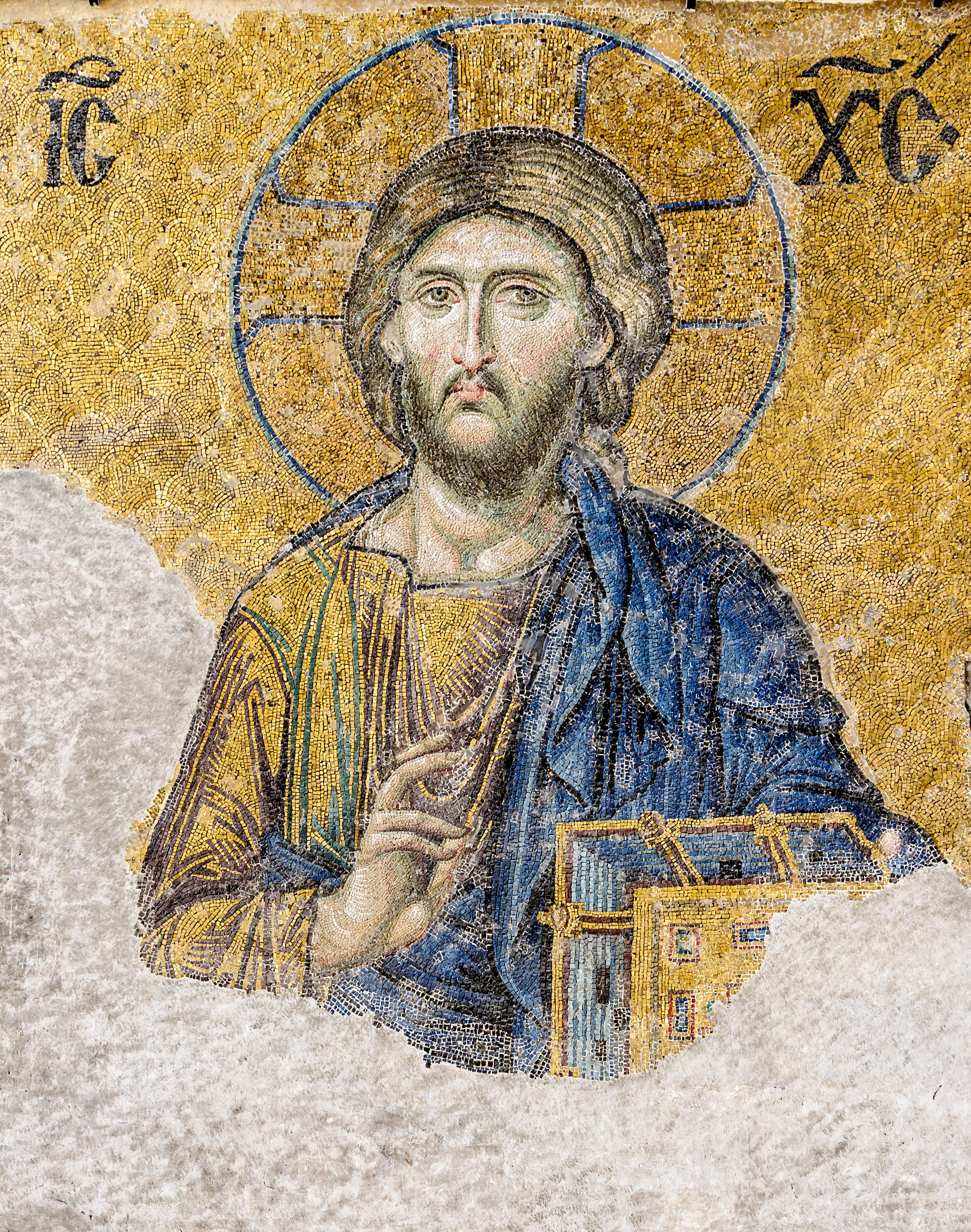
사제나 주교가 신도를 축복할 때도 십자가를 긋는데, 이때는 신도가 십자성호를 그을 때와 손가락 모양과 순서가 다르다. 사제는 오른손 손가락으로 Ιησούς Χριστός|이이스스 하리스토스el[58](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어 표기)의 머리글자인 "ΙΣΧΣ" 모양을 만든다. 즉, 검지는 펴고(Ι), 중지와 소지는 구부리며(Σ), 엄지와 약지를 교차시킨다(Χ). 이 손 모양으로 사제 자신의 시점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순서로 허공에 십자가를 그어 축복한다. 이때 신도들은 십자성호를 긋지 않는다. 주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축복하며, 때로는 양손을 사용하여 축복하기도 한다. 왼손은 오른손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몸을 축으로 하여 오른손과 선대칭이 되도록 움직인다(위, 아래, 오른쪽, 왼쪽). 공적인 자리에서 신도가 다른 신도를 축복하는 것은 삼가지만, 가족 등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 서로 십자가를 그어 축복하는 경우도 있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에서는 교회에 들어가거나 지나갈 때, 예배 시작 시, 성찬 예식 중 여러 번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첫 세 손가락을 모으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손바닥에 댄 후, 이마, 가슴 아래, 왼쪽, 오른쪽 순서로 터치하고 고개를 숙이며 다시 가슴에 펴진 손을 얹는 방식으로 행한다.[50][51]
3. 2. 1. 러시아 정교회와 고의식파
러시아 차르국에서는 17세기 니콘 총대주교의 개혁 이전까지 두 손가락으로 십자성호를 긋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니콘 총대주교는 기존의 러시아 관습을 그리스 관습에 맞추어 변경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세 손가락으로 십자성호를 긋도록 강요했다. 이는 전통적인 두 손가락 성호 방식과 달랐으며, 성상 문제, 성상 파괴 논쟁, 전례 관행 변경 등 다른 개혁 내용과 함께 분열(라스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29][30][31]


이러한 개혁에 반발한 이들은 고의식파(구교도)로 불리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두 손가락 십자성호 방식을 계속 지켜나갔다. 고의식파는 두 손가락이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함께 지닌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상징하고, 손바닥에 모은 나머지 세 손가락은 삼위일체를 나타낸다고 여겼다.[30]
정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십자 표시를 하다'''" 또는 "'''십자를 그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십자를 긋다"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된다. 십자 표시는 신앙을 드러내는 행위인 '표신(標信)'의 하나이자, 기도의 일부 또는 몸으로 표현하는 기도로 간주된다.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정교회에서도 고대부터 십자 표시를 해왔지만(동서 교회 분열은 중세에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날 정교회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형태는 중세 이후에 통일된 것이다. 이러한 십자 표시 방식의 통일에 반대하여 생겨난 분파가 바로 러시아 정교회의 고의식파이다.
3. 3. 성공회
성공회에서의 십자성호는 가톨릭교회와 동일하게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로 긋는다. 하지만 가톨릭교회처럼 예식 중에 십자성호를 그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신자 개인의 신앙심과 관습에 따라 행해진다. 성공회 내에서도 하이 처치(고교회파) 성향의 교회에서는 십자성호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로우 처치(저교회파) 성향의 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신자마다 십자성호를 긋는 빈도는 다르며, 이는 개인의 신앙적 판단에 따른다.
영국 종교 개혁 이후 성공회에서는 가톨릭교회 시절에 비해 십자성호 사용이 줄어들었다. 1549년 ''공동 기도문''에서는 성직자가 전례 중 십자성호를 긋는 횟수를 다섯 번으로 제한했지만, 신자들은 개인적인 신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38] 그러나 1552년 ''공동 기도문''(1559년 개정)에서는 세례 예식 중에 단 한 번만 사용하도록 더욱 축소했다.[38] 이때의 십자성호 방식은 머리, 가슴, 양 어깨를 차례로 만지는 것이었다.[39]
세례 시 십자성호 사용은 잉글랜드 교회 내에서 논쟁거리가 되었다. 특히 청교도들은 십자성호가 교회의 가톨릭 과거와 연결될 뿐 아니라, 악을 막는 부적처럼 여겨지는 영국 민속 전통의 영향[39]을 받은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39] 비국교도는 십자성호 사용을 거부했다.[39]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1세는 햄프턴 코트 회의와 1604년 교회법전을 통해 세례 시 십자성호 사용을 옹호했으며, 이는 청교도들이 잉글랜드 교회를 떠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38]
미국 성공회에서는 1789년 기도서에서 세례 시 십자성호 사용을 선택 사항으로 두어 교회 내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려 했으나,[38] 1892년 기도서 개정에서는 다시 의무화했다.[38] 19세기 앵글로-가톨릭 운동은 성공회 내에서 십자성호 사용을 다시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평신도뿐 아니라 교회 건축과 장식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났다.[40] 역사적으로 고교회파 신자들이 저교회파 신자들보다 십자성호를 더 많이 긋는 경향이 있었다.[41]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공회 내에서 십자성호 사용에 대한 반대는 대부분 사라졌다.[38] 일부 성공회 전통에서는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와 예배 마지막에 사제가 축복할 때 십자성호를 그으며, 신자들은 성찬을 받을 때 긋기도 한다.[42] 최근에는 일부 성공회 주교들이 서명 전에 십자 표시(+)를 하는 가톨릭의 관행을 따르기도 한다.[40]
성공회에서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관습적인 행위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된다.
3. 4. 개신교회 (루터교, 감리교 등)
개신교 내에서는 십자성호를 긋는 전통이 교파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십자성호를 사용하는 교파의 경우, 대부분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이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로 긋는 서방교회 방식을 따른다.[59] 하지만 복음주의 정교회처럼 동방 전례를 채택한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정교회와 동일하게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로 긋기도 한다. 반면, 많은 개신교 교파에서는 십자성호를 긋는 습관이 남아있지 않다.=== 루터교 ===
루터교에서는 십자성호 관습이 비교적 널리 유지되었다.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의 소(小) 교리 문답에서 아침과 저녁 기도 전에 십자성호를 긋도록 권장했다. 미주리 시노드 루터교회(LCMS)의 1941년 ''루터교 찬송가''에서는 삼위일체 관련 기도문이나 니케아 신경의 특정 구절("영원한 생명을 믿사오며")에서 십자성호를 그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32] 오늘날 루터교 예배에서는 전례의 여러 순서에서 십자성호가 관례적으로 사용된다.[33][34]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복음주의 루터교 예배서''(Evangelical Lutheran Worshipeng)나 LCMS 및 캐나다 루터교회에서 사용하는 ''루터교 예배서''(Lutheran Service Bookeng)와 같은 현대 루터교 예배 지침서들은 전례 중 특정 시점에서 십자성호를 긋도록 안내하고 있다.[35][36] 긋는 방식은 세 손가락으로 머리(이마), 가슴(심장)을 차례로 짚은 다음,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옮겨 긋는다.[37]
=== 성공회 ===
성공회에서는 영국 종교 개혁 이후 십자성호 사용이 가톨릭에 비해 줄어들었다. 1549년 ''공동 기도문''에서는 전례 중 성직자의 십자성호 횟수를 다섯 번으로 제한했지만, 신자들은 개인적인 신심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38] 그러나 1552년 ''공동 기도문''(1559년 개정)에서는 세례 때 한 번만 사용하도록 더욱 축소되었다.[38] 이때의 형태는 머리, 가슴, 양 어깨를 차례로 만지는 방식이었다.[39]
세례 시 십자성호 사용 의무화는 잉글랜드 교회 내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특히 청교도들은 이것이 교회의 가톨릭 과거와 연결되며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이라고 비판하며 사용을 거부했다.[39] 당시 십자성호는 악령을 쫓는 부적과 같은 영국 민속 신앙과도 연관되어 있었다.[39] 제임스 1세는 햄프턴 코트 회의와 1604년 교회법규를 통해 세례 시 십자성호 사용을 옹호했으나, 이는 청교도들이 잉글랜드 교회에서 분리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38]
미국 성공회는 1789년 기도서에서 세례 시 십자성호 사용을 선택 사항으로 바꾸었으나, 1892년 개정에서는 다시 의무화했다.[38] 19세기 앵글로-가톨릭 운동의 영향으로 성공회 내에서 평신도의 십자성호 사용, 교회 건축 및 장식 등에서 십자성호가 다시 활발히 사용되기 시작했다.[40] 역사적으로는 고교회파 성공회 신자들이 저교회파 신자들보다 십자성호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41]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공회 내에서 십자성호 사용에 대한 반대는 대부분 사라졌다.[38] 현재 일부 성공회에서는 성직자가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나 예배 마지막 축복 기도 시에 십자성호를 그으며, 신자들은 성찬을 받을 때 스스로 긋기도 한다.[42] 또한 일부 성공회 주교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관행을 따라 서명하기 전에 십자성호(+)를 표시하기도 한다.[40]
=== 감리교 ===
감리교에서는 연합감리교회의 전례에서 십자성호를 찾아볼 수 있다.[43] 초기 감리교의 주요 지도자인 존 웨슬리는 1784년에 개정한 ''북아메리카 감리교인의 주일 예배서''에서 목사가 세례받은 아이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긋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이후 미국 감리교회에서 받아들여졌다.[43][44] 하지만 웨슬리는 다른 예식에서는 십자성호 사용을 명시하지 않았다.[43]
20세기 초 미국 감리교에서는 십자성호 사용이 거의 사라졌으나,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43] 현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목사가 세례 시 새로 세례받는 사람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종종 기름을 바르는 예식과 함께 행해진다.[43][45] 재의 수요일에는 장로가 참회의 표시로 신자들의 이마에 재로 십자성호를 그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43][46] 또한 예배 인도자가 설교 후나 예배 마지막에 회중을 축복하며 십자성호를 긋기도 하고, 신자 개개인이 성찬을 받을 때 스스로 십자성호를 긋는 경우도 있다.[43] 목사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를 기원할 때 이마에 기름을 바르며 십자성호를 긋기도 한다.[47] 일부 감리교 성직자들은 성찬상 앞에서나 죄의 고백과 용서 예식 중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성호를 사용하기도 한다.[48]
개인 기도 시 십자성호를 사용하는 것은 감리교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연합감리교회는 이를 의미 있는 신앙 실천으로 권장하며, 공식 예식 외에서도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43]
=== 개혁교회 ===
일부 개혁교회 전통에서도 십자성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교회나 미국 장로교회 등에서는 세례를 베풀거나 세례 언약을 재확인하는 예식에서 이마에 십자성호를 긋기도 한다.[49] 또한 축도 시에 목사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회중을 향해 십자성호를 그으며 축복하는 경우도 있다.
4. 십자 성호의 의미
성호는 보편교회 시절인 2세기 이후부터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에는 엄지나 집게 손가락으로 이마에만 작게 십자가를 그렸다. 4세기부터는 기독교의 공인된 의식인 예전에서도 이마와 가슴에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전통이 생겼다.
보편교회 시기의 십자 성호 순서는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였다.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에도 동방정교회, 동방천주교회 등 동방교회는 이 순서를 유지했다. 반면, 천주교회와 성공회, 루터교 등 개신교 일부를 포함하는 서방교회는 13세기 무렵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십자 성호를 그을 때는 일반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성호경을 함께 외운다.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신앙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다.[59] 구체적인 동작은 손으로 이마, 가슴 아래 또는 배, 양쪽 어깨 순으로 만지며 삼위일체의 말씀을 읊는 것이다. 이마를 만지며 "성부와" (In nomine Patris|la), 배 또는 가슴을 만지며 "성자와" (et Filii|la), 양 어깨를 차례로 만지며 "성령의" (et Spiritus Sancti|la)라고 외우고, 마지막으로 "아멘"을 읊는다.[11] 손가락은 삼위일체 교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세 손가락을 모아서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대에는 손 전체를 펴서 사용하기도 한다.[59]
교부들은 십자 성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다.[12] 이마는 천국을, 명치(또는 배 위쪽)는 땅을, 어깨는 권능의 장소를 상징하며, 삼위일체와 성육신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았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십자 성호는 세 손가락으로 긋는데, 이는 삼위일체를 부르는 것과 함께 행해지기 때문이다. [...] 이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13] 허버트 서스턴은 과거 동방과 서방 기독교인 모두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손을 옮겼다고 주장했으나, 독일 신학자 발렌틴 탈호퍼는 인노첸시오 3세 등의 글이 어깨를 가로지르는 큰 십자 성호가 아니라 이마 등에 그리는 작은 십자 성호에 관한 것이며, 이 경우 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해석했다.[5]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의 변형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오른손을 성수에 담갔다가 성호를 긋거나, 예수 기도나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와 같은 기도를 함께 읊기도 한다. 스페인, 이탈리아, 라틴 아메리카 등 일부 가톨릭 지역에서는 검지와 엄지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성호가 끝날 때 엄지에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다.[14]
예루살렘의 키릴로스 (315–386)[15]는 십자 성호의 힘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16]
: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악마들은 그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십자 성호를 보기만 해도 몸서리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 [...] 누구도 지치지 마십시오. 십자가 자체를 위한 싸움에서 적들에 맞서 당신의 갑옷을 착용하십시오. 반대자들에 맞서 십자가의 믿음을 전리품으로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 불신자들과 논쟁을 벌이려 할 때, 먼저 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러면 반대자는 침묵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찾는 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오 28:5)
: [...]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십자가가 우리 이마와 모든 것에, 우리가 먹는 빵과 마시는 잔 위에,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 잠자리에 들기 전, 누울 때와 일어날 때, 길을 갈 때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손가락으로 담대하게 그리는 우리의 인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은 훌륭한 보존 수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격이 없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수고가 없으며,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한 자들의 표징이며, 악마들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15) [...][16]
다마스쿠스의 요한 (650–750)은 십자가 형상 자체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17]
: 게다가 우리는 귀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형상, 비록 다른 나무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숭배합니다.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럴 리는 없지만) 십자가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숭배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경고하며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오 24:30)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천사도 여자에게 "너희가 찾는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16:6) 그리고 사도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토전서 1:23) [...]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징을 숭배해야 합니다. 그 표징이 있는 곳에는 그분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18]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십자 성호를 준성사로 간주한다. 이는 "성사(聖事)와 유사한 거룩한 표징"으로 정의되며, "교회의 중재를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준성사는 "항상 기도와 함께 손 얹기, 십자 성호, 또는 성수 뿌리기(세례를 연상시키는)와 같은 특정한 표징을 포함한다."[20] 가톨릭교회 교리서(CCC) 1670항에 따르면, 준성사는 성사처럼 은총을 직접 부여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에 협력하도록 돕는다. 신심 깊은 신자들에게 성사와 준성사의 전례는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신적 은총으로 삶의 거의 모든 사건을 거룩하게 한다.[20] CCC 1671항은 축복(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이 준성사 중 첫 번째이며, 모든 축복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선물을 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베풀고, 이때 보통 그리스도의 십자 성호를 긋는다.[20] CCC 2157항은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활동할 때 십자 성호를 긋는다고 명시하며, 이는 하루를 하느님의 영광에 바치고 구세주의 은총을 청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또한 십자 성호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신자를 강하게 한다고 덧붙인다.[21] 요한 비안네는 진정으로 긋는 십자 성호가 "모든 지옥을 떨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22]
가톨릭 미사의 로마 전례의 통상 전례에서는 입당 성가 끝에 사제와 신자들이 십자 성호를 긋는다. 또한 복음 선포 시 사제나 부제가 책과 자신의 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 성호를 긋는다.[23] 평신도는 미사 시작 인사와 마지막 축복 때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이 권장되며, 성수 축복을 받을 때, 참회 예식 후, 복음 봉독 전(이마, 입술, 가슴에 작은 십자 성호) 등 개인적인 신심에 따라 다른 때에도 십자 성호를 그을 수 있다.
십자 성호는 삼위일체를 기억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이마: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생각이 사랑으로 향하기를 소망함.
- 가슴: 하느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함.
- 오른쪽 어깨: 하느님의 힘으로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함.
- 왼쪽 어깨: 사랑의 행위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릴 수 있기를 소망함.
또한, 십자 성호를 긋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얻는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는 의미도 지닌다.
참조
[1]
웹사이트
The Prayer of the Veil
http://www.coptic.ne[...]
Encyclopedia Coptica
2016-10-14
[2]
웹사이트
Apostolic Tradition
http://www.stjohnsar[...]
St. John's Episcopal Church
2020-09-05
[3]
서적
The Cross in Tradition, History, and Art
G.P. Putnam's Sons
1898
[4]
서적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Idiom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07-08
[5]
뉴스
Sign of the Cross.
http://www.newadvent[...]
The Catholic Encyclopedia
1912-01-20
[6]
서적
The Sign of the Cross
Paraclete Press
2006
[7]
뉴스
Archæology of the Cross and Crucifix.
http://www.newadvent[...]
The Catholic Encyclopedia
1908-01-20
[8]
서적
Christian Confessions: A Historical Introduc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9]
서적
Religion and the Human Sciences: An Approach Via Spiritual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N.Y.: 1998)
[10]
서적
The Law of God
Holy Trinity Monastery (Jordanville, New York)
2019-03-13
[11]
서적
The Externals of the Catholic Church
P.J. Kenedy & Sons
1918
[12]
서적
Prayer Book
[13]
간행물
De sacro altaris mysterio
[14]
서적
Linking Your Beads: The Rosary's History, Mysteries, and Prayers
Our Sunday Visitor
2011
[15]
서적
Isaiah 40-66
Intervarsity Press
2007
[16]
웹사이트
Catechetical Lecture 13
https://www.newadven[...]
[17]
서적
Isaiah 1-39
Intervarsity Press
2004
[18]
웹사이트
An Exposition of the Orthodox Faith, Book IV
https://www.newadven[...]
[19]
서적
The Sign of the Cross
Paraclete Press
2006
[20]
웹사이트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https://www.vatican.[...]
1992
[21]
웹사이트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https://www.vatican.[...]
1992
[22]
웹사이트
Making the Sign of the Cross
http://www.catholicd[...]
Catholic Digest
[23]
웹사이트
The Order of Mass (The Ordinary Form of the Roman Rite): In Latin and in English
http://resources.ip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nglish in the Liturgy
2010
[24]
서적
Eastern Orthodox Christianity: A Western Perspective
Baker Publishing
2003
[25]
서적
The Orthodox Liturgy: The Development of the Eucharistic Liturgy in the Byzantine Rite
St. Vladimir's Press reprint
2003
[26]
서적
Orthodox Christian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27]
서적
The Orthodox Liturgy: The Development of the Eucharistic Liturgy in the Byzantine Rite
St. Vladimir's Press reprint
2003
[28]
서적
Eastern Orthodox Christianity: A Western Perspective
Baker Publishing
2003
[29]
서적
The Old Believers in Imperial Russia: Oppression, Opportunism and Religious Identity in Tsarist Moscow
2018
[30]
서적
Russia's Path Toward Enlightenment: Faith, Politics, and Reason, 1500-1801
Yale University Press
2016
[31]
간행물
Old Believer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Brill
[32]
서적
The Lutheran Hymnal
Concordia Publishing House: St. Louis
1941
[33]
웹사이트
Why Do Lutherans Make the Sign of the Cross?
http://www.elca.org/[...]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2007-06-16
[34]
웹사이트
Sign of the Cross
http://www.lcms.org/[...]
Lutheran Church - Missouri Synod
2007-09-12
[35]
서적
Evangelical Lutheran Worship
Augsburg Fortress
2006
[36]
서적
Lutheran Service Book
Concordia
2006
[37]
웹사이트
Making the Sign of the Cross
http://redeemernashv[...]
Redeemer Lutheran Church
2017-05-24
[38]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Anglicanism
Rowman & Littlefield
2015
[39]
서적
The Beauty of Holiness: Anglicanism and Architecture in Colonial South Carolin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40]
서적
The A to Z of Anglicanism
Scarecrow Press
2009
[41]
서적
What Is Liturgy?
Forward Movement Publications
1996
[42]
서적
All Things Anglican: Who We Are and What We Believe
Canterbury Press
2018
[43]
웹사이트
Why don't we make the sign of the cross?
https://www.umc.org/[...]
United Methodist Church
2022-09-19
[44]
서적
John Wesley's Prayer Book: The Sunday Service of the Methodists in North America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by James F. White
OSL Publications
1991
[45]
서적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1992
[46]
서적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1992
[47]
서적
The United Methodist Book of Worship
1992
[48]
웹사이트
Prepared and Cross-Checked
http://www.revneal.o[...]
Grace Incarnate Ministries
2019-04-25
[49]
서적
Presbyterian Worship: A Guide for Clergy
Geneva Press
2002
[50]
웹사이트
Making the Sign of the Cross (Khachaknkel)
http://www.armenianc[...]
2015-12-06
[51]
웹사이트
In the Shadow of the Cross: The Holy Cross and Armenian History
http://www.armenianc[...]
2015-12-06
[52]
서적
The Anaphoral Genesis of the Institution Narrative in Light of the Anaphora of Addai and Mari
Edizioni Orientalia Christiana
[53]
웹사이트
Sign of the Cross - OrthodoxWiki
http://orthodoxwiki.[...]
[54]
웹사이트
教皇フランシスコ、2014年9月14日「お告げの祈り」でのことば
http://www.cbcj.cath[...]
[55]
웹사이트
月報「コイノニア」2008年8月号 No.300《シリーズ・色々な礼拝》祝福のしるし 聖餐式での十字の切り方 司祭 ミカエル 藤原健久
http://www.nskk.org/[...]
[56]
웹사이트
かたち-象徴や表信:日本正教会 The Orthodox Church in Japan
http://www.orthodoxj[...]
[57]
웹사이트
信仰の学び、養いを生涯続ける① ルーテル学院大学・神学校名誉教授 徳善 義和
http://www.jelc.or.j[...]
[58]
문서
現代ギリシャでも用いられる語であるため、現代ギリシャ語から転写した。古典再建音では「イエースース・クリストース」となる。また、「ハリストス」は転写によっては「[[フリストス]]」となるが、正教会用語として[[日本正教会]]での標準的表記である「ハリストス」を本項では採用した。
[59]
서적
성공회 용어사전
대한성공회 선교교육원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