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활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김활란은 대한민국의 교육자, 여성운동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장,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며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후반 친일 행위로 인해 논란이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여성 교육과 계몽 운동,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보실장, 유엔 총회 참석, 순회대사 등을 지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한국의 판타지 작가 - 박인덕
박인덕은 1896년에 태어나 1980년에 사망한 교육자이자 사회운동가로, 이화학당 졸업 후 교사로 활동하며 3.1 운동에 참여하고 미국 유학 후 여성 계몽 운동과 실업 교육에 힘썼으며 인덕실업학교를 설립했다. - 여자 교육자 - 메리 스크랜튼
메리 스크랜튼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선교사로,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여성 교육에 기여하고 여러 학교와 병원을 지원하며 한국 사회 발전에 헌신하다 1909년 사망했다. - 여자 교육자 - 윤정옥
윤정옥은 일제강점기 출생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및 교수를 역임하고 여성 운동과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썼으며, 유관순상 등을 수상했다. - 대한민국의 공보처 장관 - 김동성 (1890년)
김동성(1890년)은 일제강점기 언론인, 만화가, 정치인으로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하고 한국 최초의 4컷 만화를 발표했으며, 해방 후 공보처장,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 대한민국의 공보처 장관 - 최병렬 (정치인)
최병렬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제12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고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을 지냈으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정계를 은퇴, 2022년 별세했다.
2. 생애
인천의 현대적인 대가족에서 태어났다.[4] 소녀 시절에는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5]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22년 한국 YWCA 설립에 참여했다.[6]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1924),[4] 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1931),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1931)를 받았다.[4]
1931년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자대학교) 학장이 되었고,[7] 이후 이 학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여자 대학교로 성장했다.[8]
초기에는 전국 여성 단체인 권우회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의 봉건적 관습과 식민 통치의 제약을 종식시키려 했으나,[4]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들과의 협력에는 소극적이어서 오래 활동하지는 않았다.[9] 1923년에 제안했던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어, 1939년 10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세계 감리교 및 통합교회 여성 연맹(WFMUCW)이 창립되는 데 기여했다.[2]
광복 후인 1945년에는 오천석, 유옥겸, 백낙준과 함께 한국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군정의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10] 1948년 제1공화국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공보실장으로 임명되었으며,[4] 1949년 보스턴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5] 공보실장 재임 중 영어 신문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코리아 타임스 창간에 기여했고, 제호 선정에도 관여했다.[11] 코리아 타임스는 1950년 11월 1일에 창간되었다.[11]
2. 1. 생애 초기
우월 김활란은 1899년 2월 27일 인천부에서 사업가 김진연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박도라 사이에서 3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18] 본명은 김기득(金己得)이었으나, 7세 때 감리교에 입교하며 받은 세례명 '헬렌(Helen)'을 아버지가 한자로 고쳐 '활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18]1907년 인천 영화학당에 입학하여 신교육을 받았고,[18][5] 이듬해 가족이 한성부로 이사하면서 이화학당에 편입하여 보통부, 중등부, 고등보통부를 거쳤다.[18] 1916년 이화학당 대학부에 입학하여 1918년 제1회로 졸업했다.[18][6]
졸업 후 이화학당 고등보통과 영어 교사로 활동했으며,[18] 1919년 3.1 운동 당시 비밀 결사에 참여하였다.[18] 1920년에는 '이화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 각지를 돌며 농촌 계몽과 복음 전도 활동을 벌였다.[18] 19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기독학생연맹 대회에 조선 여성 대표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18] 1923년 김필례, 유각경 등과 함께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를 창설하는 데 참여했다.[6]
2. 1. 1. 출생과 유년기
우월 김활란은 1899년 2월 27일 인천부 동구 창영동(당시 우각동) 배다리 마을에서 태어났다.[18] 아버지는 사업가 김진연,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박도라였다.[18] 아버지 김진연은 본래 평안북도 철산군 출신의 중농(中農)이었으나, 구한 말 개항된 제물포로 이주하여 창고업을 했다.[18] 어머니 박도라는 내리교회의 전도 부인 헬렌에게 전도받았으며, 후일 온 가족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18]
김활란은 3남 5녀 중 막내였다.[18] 본명은 기해년에 태어났다고 하여 ‘김기득’(金己得)으로 지어졌고,[18] 아호는 우월(又月)인데, 이는 형부 김달하가 지어준 것이다.[18] 7세 때 감리교에 입교하면서 ‘헬렌’(Helen)이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이를 아버지가 한자로 바꾸어 ‘활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18]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18] 언니 김신득(다른 이름 김애란)의 딸인 김정옥은 후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동구여자중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18]
1907년,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신교육 기관이었던 인천의 영화학당에 입학했다.[18] 이듬해인 1908년 가족이 한성부로 이사하면서 이화학당으로 편입하여 보통부, 중등부, 고등보통부를 다녔다.[18]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박도라는 "나의 무지를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딸들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업을 중단시킨 적이 없었다.[18]
2. 1. 2. 학창 시절
1907년 인천 영화학당에 입학하여 신교육을 받기 시작했다.[5] 1908년 가족이 한성부(현 서울특별시)로 이사하면서 이화학당으로 편입하였다. 이화학당 보통부, 중등부, 고등보통부를 거쳐 1916년 이화학당 대학부에 입학했으며, 1918년 졸업하였다.[6]졸업 후 이화학당 교사로 활동하던 중, 조선 감리교 감독이었던 웰치(H. Welch) 선교사의 추천과 지원을 받아 1922년 10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4]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철학, 교육학, 웅변학 등을 공부하였다. 유학 중이던 1923년 6월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세계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1924년 6월,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를 우수 졸업생으로 마치고 학사 학위를 받았다.[4]
2. 1. 3. 신앙 및 사회 활동
소녀 시절 기독교 학교에 다녔으며,[5]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22년 한국 YWCA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다.[6] 1923년에는 여성을 위한 세계적인 감리교 조직 설립을 제안했으며, 이는 1939년 10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27개국 대표가 세계 감리교 및 통합교회 여성 연맹(WFMUCW) 창립 헌장에 서명하는 결실을 보았다.[2][13] 이 단체는 김활란이 1920년대에 구상하여 시작한 프로젝트였다.[2][13] WFMUCW의 목표는 복음 전파, 치유 사역, 교육 및 사회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고, 전 세계 선교 사업 증진, 여성들과의 교제 및 상호 지원, 평화와 정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등이다.[14]또한 전국 여성 단체인 권우회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에 남아있던 봉건적 관습과 식민 통치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 활동했다.[4]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어서 오랫동안 참여하지는 않았다.[9]
광복 후인 1945년에는 오천석, 유옥겸, 백낙준과 함께 한국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국 교육부와 협력하며 한국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10] 1948년에는 제1공화국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공보실장을 맡았고,[4] 이듬해인 1949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5] 공보실장 재임 중 영어 신문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코리아 타임스 창간에 기여했으며, 신문 제호 선정에도 관여했다.[11] 코리아 타임스는 1950년 11월 1일에 창간되었다.[11]
2. 1. 4. 미국 유학
192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 2학년에 편입했다. 1924년 6월 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4] 이후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1925년 6월 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31년 10월에는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eng)"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4]2. 2. 일제 강점기 활동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후 1922년 한국 YWCA 설립에 참여했다.[6]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1924)를 받았고,[4] 보스턴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학위(1931),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1931)를 취득했다.[4] 박사 과정 중에는 재미 한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등 민족 지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유학 중이던 1928년에는 "무지와 구습의 타파"를 이유로 공개적으로 머리를 잘라 화제가 되었으며,[5] 같은 해 미국 캔자스에서 열린 미국 기독교 감리회 대회에 조선인 대표로 참석했다. 1929년 11월에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태평양문제연구회의에 윤치호, 송진우, 유억겸, 백관수와 함께 조선 대표로 참석했다. 1930년 실론섬에서 개최된 여자기독교 청년회 동남아시아대회에 참석한 뒤, 1931년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자대학교) 학장이 되었다.[7]
초기에는 여성 단체인 권우회에 참여하여 봉건적 관습 타파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4] 1939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세계 감리교 및 통합교회 여성 연맹(WFMUCW) 창립에 기여하기도 했다.[2] 이후 교육 활동과 사회 활동을 이어갔으나, 1930년대 후반부터는 전시 체제 하에서 친일 활동에 가담하게 된다.
2. 2. 1. 교육 및 사회 활동

1931년 10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eng)"이라는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4] 이는 송복신에 이어 한국 여성으로는 두 번째 박사 학위 취득이었다. 유학 중이던 1928년에는 "무지와 구습의 타파"를 내세우며 공개적으로 단발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귀국 후 1931년 6월, 덴마크의 경제 부흥 사례를 소개하는 《정말인(丁抹人)의 경제부흥론》을 저술하여 실력 양성론에 기반한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당시 경제적, 정신적으로 침체되었던 덴마크가 산업, 농업, 경제 각 부문에서 실력을 양성하여 부흥한 과정을 소개했다.
1932년 9월부터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서 학감(교감) 및 부교장을 지냈으며,[7] 부교장 재직 중이던 1935년 11월 잠시 교장 대리를 맡았다. 이때 그는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교장이었던 앨리스 아펜젤러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1939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 제7대 교장으로 취임했다.
학교 활동 외에도 농촌 교육을 통한 문맹 퇴치와 여성 계몽에 힘썼다. 브나로드 운동에 참여하여 농촌 계몽 운동을 추진했으며, 문맹 퇴치, 가정 경영 지식 보급, 개인적 차원의 경제 자립 지원, 봉건적 인습 타파, 의복 개량 등을 도왔다. 농한기에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이나 교회 전도 강연을 열기도 하였다. 또한 안산 샘골에서 농촌 아동 교육과 여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최용신을 재정적, 정신적으로 지원하여 시설을 갖추도록 도왔다.
YWCA(여자기독교청년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김필례와 함께 조직 확장에 힘썼고,[6] 직접 회원 모집과 기독교 선교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외 기독교 관련 회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여 1928년 미국 감리회 대회, 1930년 실론섬 YWCA 동남아시아대회, 1932년 북미 기독교 감리 회의, 1934년 세계 YWCA 동남아시아 회의 등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는 등 기독교 단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939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열린 세계 감리교 여성 연맹(WFMUCW) 창립에 기여했는데, 이는 김활란이 1923년부터 추진해 온 활동의 결실이었다.[2] 한편, 여성 단체인 권우회에 참여하여 봉건적 관습과 신앙을 타파하는 데 힘썼으나,[4]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들과의 협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오래 활동하지는 않았다.[9]
2. 2. 2. 친일 논란
1936년 말부터 교육과 여성 계몽 분야에서 친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칼럼 기고와 강연 활동에 나섰으며, 1937년부터는 조선총독부가 지원하는 조선부인연구회, 방송선전협의회, 애국금차회 등에 참여했다.김활란은 김복수 등 상류층 여성들과 함께 애국금차회를 조직하여 금비녀와 금가락지를 모아 일제의 국방비로 헌납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선언론보국회, 조선임전보국단 등 친일 단체를 통해 수백 차례 시국 강연에 나섰다. 《동양지광》, 《조광》, 매일신보 등 신문과 잡지에 일본 제국의 전쟁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내선 일체를 강조하는 논설을 수백 차례 기고하며 일제 말기 전시 체제에 적극 협력했다. 일본 제국의 한민족 말살 정책인 신사참배 강요에도 협력했으며, 징병과 학병을 권유하는 강연에도 앞장섰다.
1943년 12월, 전시교육임시조치령에 따라 이화여자전문학교가 폐교되고 '여자특별연성소'라는 농촌 지도원 양성 기관으로 개편되자, 이를 옹호하는 글을 매일신보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해방 이후 친일파로 지목되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에 포함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화여대 교정에 설치된 그의 동상에 대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철거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다.[3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펴낸 자료집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에서 윤치호, 신흥우와 함께 김활란을 감리교 내 친일 부역자 12명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32]
김활란은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 "혹독한 식민지 정책 하에서 이화학당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감리교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고 보았다.[5]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초상이 불태워지거나[4] 학생들이 동상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6]
다음은 김활란의 친일 발언 및 기고문의 일부이다.[35]
- '''부인들끼리의 애정과 이해 - 내선 부인의 애국적 협력을 위하여''' (1939년 6월, 《동양지광》)
: 과거 조선의 부인운동은 어쨌든 화려한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로 구호에 불과한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선 일체의 대업 속에서 정말로 확고하게 현실성이 있는 부인운동이 전개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무장''' (1941년 12월 27일,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결전부인대회)
: 저 흑노(黑奴) 해방(노예 해방)의 싸움을 성전이라 했고 십자군의 싸움도 성전이라 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정말로 내려진 것이다. 동아 10억의 민족을 해방하고 광명으로 인도하려는 도의의 전쟁이다. 우리 총후의 반도 여성은 지금 이 도의 전쟁에 한 사람의 투사로서 가담하고 있다는 광영(光榮)을 가졌다.
-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 (1942년 12월)
: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중략)…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 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거룩한 대화혼을 명심 - 적 결멸에 일로매진''' (1943년 8월 7일, 매일신보)
: 이 기회에 대동아 건설을 위하여 동아 10억의 민족을 저 앵글로 색슨의 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 황군이 도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때에 반도 청년에 이러한 영예를 내리옵심은 더욱 기쁜 바이며, 또한 행복된 일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배속으로부터 대화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 존엄하옵신 황실을 받들어 모시고 생사를 초월하여 대군을 위하여 순국 봉사하는 그 마음 오직 우리 황국 신민만이, 특히 제국 군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다.
- '''뒷일은 우리가''' (1943년 12월, 조광)
: 학병제군 앞에는 양양한 전도가 열리었다. 몸으로 국가에 순(殉)하는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제군은 오늘 이때를 영구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가라! 전선으로. 그 뒤는 우리가 맡겠다. 총후의 여성들은 제군들이 안심할 만큼 만사를 해내일 각오가 굳은 바이니, 바라건대 모쪼록 빛나는 전공을 세워 조선학도의 참다운 일면을 길이 청사에 빛내여라!
- '''남자에 지지 않게 황국 여성으로서 사명을 완수''' (1943년 12월 25일, 매일신보)
: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여자특별연성소로 개편된 것에 대해) 그러나 싸움이란 반드시 제일선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여자특별연성소 지도원 양성 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생도들도 황국 여성으로서 다시 없는 특전이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 '''감격과 가중한 책임 - 진두에 나설 여학생의 결의''' (1938년 6월 9일, 매일신보)
: (조선 YWCA의 일본 YWCA 가맹 발표문에서) 비상시국에 있어 기독교 여자 청년들도 내선 일체의 깃발 아래로 모여 시국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황국 신민으로서 앞날을 자기(自期)하는 의미에서…
2. 3. 광복 이후 활동
광복 이후 김활란은 교육 및 정치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오천석, 유억겸, 백낙준 등과 함께 한국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했으며[10],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정부의 초대 공보실장으로 임명되었다.[4] 이후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고[5], 코리아 타임스 창간에 기여하는[11]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2. 3. 1. 해방 직후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1945년 8월 임영신, 이은혜 등과 함께 여자국민당을 조직하였다.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후, 미군정청의 한국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오천석, 유억겸, 백낙준 등과 함께 설립한 것으로[10], 미국 교육국의 협조를 받아 학교 및 교직원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했다.[10] 같은 해 9월, 일제강점기 말 폐교되었던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다시 열고 교장을 맡았다.
학교 재건 직후, 미군 당국이 이화여전 건물을 군용 병원으로 사용하겠다며 닷새 안에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김활란은 이를 '앞이 캄캄했으며, 너무나도 무력한 한국의 처지에 슬퍼하고 분노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미군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으나 미군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 마침 서울에 와 있던 미국 뉴스위크 기자 헤롤드 아이삭스를 설득하여 그의 도움으로 미군정 사령관 존 하지 장군을 직접 만났다. 김활란은 하지에게 “일제 때도 내놓지 않았던 학교입니다. 지금 해방된 한국에서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을 내놓으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십시오. 미국의 어떤 여자대학을 군에서 밀고 들어갔다면 어떤 여론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셨습니까?”라고 항의했다. 하지는 강제 점령이 아닌 상이 군인을 위한 협조 요청임을 강조하며 더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설득하려 했으나, 김활란은 “이 학교는 나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수많은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전국 여성의 여론을 들은 후에라야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며 끝까지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하지는 김활란의 논리적인 주장에 설득되어 이화여대 건물 사용 계획을 철회했다.
2. 3. 2. 미군정 시기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1945년 8월 임영신, 이은혜 등과 함께 여자국민당을 조직하였다. 같은 해 9월 미군이 주둔한 후 미군정청 한국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고,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복구하여 교장을 맡았다. 미군이 이화여전 건물을 군용 병원으로 사용하려 하자, 김활란은 미군정 사령장관 존 하지에게 직접 항의하여 이를 막아냈다. 그는 “일제 때도 내놓지 않았던 학교”라며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하지 장군은 건물 사용 계획을 철회했다.[4][5][6][10]1946년에는 여자교육담당 교육자문위원을 겸직하며 여성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 미군정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여성 대학의 필요성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공 분야 개척을 주장하며 군정청 관리들을 설득했다. 그 결과 1946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되었고, 김활란은 초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 의석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는 날이 올 때까지 안 된다'며 이화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제안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시기 여성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45년 9월 여성기독교청년회(YWCA)를 재건하고 회장이 되었으며, 여성 교육 진흥을 위한 한국여학사회를 창설하여 초대 회장을 맡았다.[6]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김구 등 반공주의 노선을 지지하며 여성의 정치적 발언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1945년 10월 이승만의 귀국을 영접하고 대한독립촉성중앙회에 참여했으며, 12월에는 독립촉성국민회의 여성 조직인 대한독립촉성부인회를 조직하여 이끌었다. 또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김구가 주도한 반탁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1945년 12월 30일 결성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위원이 되었다.[26] 1946년에는 우익 여성단체인 독립촉성중앙부인단에 참가하는 등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1946년 2월 민주의원의 비서로 참여하였고, 같은 해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민주의원 대표 자격으로 파견되어 조선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독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1946년에는 중화민국 항저우에서 열린 YWCA 세계대회에 조선 여성 대표로 참석했다. 1948년 1월 남북협상론과 단독정부 수립론이 대립하자 이승만을 지지하며 단독정부 수립 지지를 선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교육, 여성 운동, 정치, 외교 등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며 배화학원, 국제대학, 동구학원, 금란여중고, 영란여중고 등 여러 학교의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학사협회, 대한부인회, 주부클럽연합회, YWCA 등 여성 단체를 이끌며 여성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했다.
공직 활동으로는 정부 수립 직후 유엔 총회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초대 공보처장(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4] 1949년에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했다.[5] 공보처장 재직 시 영어 신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코리아 타임스(The Korea Times)라는 제호를 직접 선정하여 1950년 11월 1일 창간에 기여했다.[11] 한국 전쟁 중에는 전시 내각의 공보처장을 역임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는 대한민국 순회대사로 활동하며 외교 무대에서도 역할을 했다.
종교 활동에도 힘써 기독교 여성 계몽 운동과 선교 활동에 참여했다. 1961년 금란전도협회를 조직하여 농촌 전도 활동을 펼쳤고, 대한기독교교육자협회 회장, 전국복음화운동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1962년 신경염으로 투병했으나 회복 후 1964년까지 양주, 인천, 포천, 충주, 부여, 원주, 전주, 대전, 신탄진, 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전도 여행을 다녔다.
1961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 명예총장 겸 이화학원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1962년과 196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1963년 8월 교육 부문 대한민국장을 수훈했으며, 같은 해 막사이사이상(공익 부문)과 미국 감리교회의 다락방상을 수상했다. 1964년 5월에는 미국 웨스턴하우스의 타임캡슐 사료편찬위원(교육 부문)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김활란은 일제강점기 말기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2001년 <월간중앙> 8월호는 1948년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작성한 '숙청대상 친일인사 명단 초안'에 김활란이 숙청대상 중 두 번째로 올라 있었다고 보도했다.[27]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며 교육, 여성 운동, 기독교 활동에 헌신했다.
2. 3. 3. 최후
1966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4차 유네스코 총회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1969년 3월 개교한 영란여자중학교·영란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을 주도했으며,[30] 1970년까지 이화학당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있었다.1970년 1월 초,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아왔소, 육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 오느라 힘 썼습니다."라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해 1월부터 당뇨병과 동맥경화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석에 누웠고, 2월 5일에는 뇌일혈(뇌출혈), 심장 질환(심장실조증, 부정맥) 등의 합병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결국 1970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85번지 1번지 자택에서 과로와 지병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당시 나이는 72세였다.
생전에 "인간의 생명이란 불멸하여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되니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슬퍼할 필요는 없으며 장례식 대신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예배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거행된 장례식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음악회와 가벼운 만찬 형식으로 치러졌다.
저서로는 자서전 《그 빛 속의 작은 생명》(1965) 등이 있다.
3. 사상과 신념
김활란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화여자대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그는 여성 대학의 필요성과 함께, 세계 대학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전공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4] 미군정 시기 교육위원회 위원과 여자교육담당 교육자문위원을 맡아 여성 교육 확대에 기여했으며, 1946년 이화여자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자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화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 의석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는 날이 올 때까지 안 됩니다'라며 반대한 일화는,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음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는 권우회와 같은 여성 단체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봉건적 관습과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했다.[4]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 운동가들과는 협력하기를 꺼렸는데[9], 이는 그의 활동이 특정 이념적 노선에 기반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으로는 확고한 반공주의 신념을 가졌으며, 이승만, 김구와 같은 우파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지지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려 노력했고, 해방 후 이승만의 귀국을 영접하고 대한독립촉성중앙회에 참여했다. 또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여성 조직인 대한독립촉성부인회를 조직하여 이끌었으며, 1948년에는 이승만 정부의 초대 공보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4]
3. 1. 여성 교육과 계몽 운동
김활란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활동은 YWCA 참여와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1922년 한국 YWCA를 설립하는 데 참여했으며[6], 1920년대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김필례와 함께 YWCA 조직 확장에 힘썼다. 또한 1926년에는 여성에 대한 인습적 제약을 타파하기 위해 단발 운동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미국 유학 후 1931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4]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 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eng>에서는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교육과 계몽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귀국하여 《정말인(丁抹人)의 경제부흥론》을 저술,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민족 정신 쇄신, 민중 계몽과 교육, 협동조합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력 양성론에 기반한 사회 발전을 모색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협동조합운동이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다. 1931년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자대학교) 학장이 되었다.[7]
1932년부터 1939년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학감(교감) 및 부교장을 지냈다. 이 시기 학교 운영을 두고 교장 앨리스 아펜젤러와 갈등을 겪기도 했는데, 윤치호와 양주삼 등은 이들의 갈등을 지켜만 보며 내분이 격화되기도 했다. 학교 일 외에도 농촌 교육을 통한 문맹 퇴치와 여성 계몽 활동에 주력했다. 브나로드 운동에 동참하여 농촌 계몽을 추진했는데, 문맹 퇴치, 가정 경영 지식 보급, 경제 자립 지원, 봉건적 인습 타파, 의복 개량 등을 목표로 삼았다. 농한기에는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회 전도 강연을 열기도 했다. 안산 샘골에서 농촌 아동 교육과 여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최용신에게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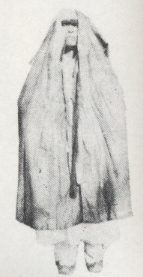
전국 여성 단체인 권우회에 참여하여 봉건적 관습과 식민 통치의 제약을 종식시키려 했으나[4],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들과의 협력을 꺼려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9]
해방 후 1945년 9월 YWCA를 재건하고 회장이 되었으며, 여성 교육 진흥을 위해 한국여학사회를 창설하여 초대 회장을 맡았다. 미군정 시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여자교육담당 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교육 확대에 기여했다.[10]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1946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시키고 초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여성 대학의 필요성과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공 분야 개척을 강조했으며, '한국 국회의원 의석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는 날이 올 때까지 안됩니다.'라며 이화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제안을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김활란의 여성 교육 및 계몽 운동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그의 활동은 점차 우파 및 반공주의 노선과 결합되었고[26], 일제강점기 말기부터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 그 순수성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1년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김활란은 1948년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작성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포함되기도 했다.[27]
3. 2. 기독교 신앙과 선교 활동
김활란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그의 사회 활동은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소녀 시절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5], 이는 그의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1922년에는 한국 YWCA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6] 이는 한국 여성 운동과 기독교 사회 운동의 중요한 시작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1920년대 후반 미국 유학 시절, 미국 내 주요 교단들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의 선교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본 교단 산하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는 미국 감리교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조선 내 독자적인 감리교 조직과 활동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1928년 미국 감리교회 총회에서는 조선 주재 감독 파송 중단 결정을 철회시키고 독립된 조선 감리교회의 지위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는 뛰어난 웅변가로서 국제 사회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김활란은 1923년 전 세계 감리교 여성들을 하나로 묶는 조직의 필요성을 처음 제안했으며, 이는 1939년 10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27개국 대표들이 모여 세계 감리교 여성 연맹(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Women, WFMUCW)을 창립하는 결실을 보았다.[2] 이 단체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리자'''라는 표어 아래[13], 복음 전파, 치유 사역, 교육 및 사회 봉사, 전 세계 선교 사업 증진, 여성들 간의 교류와 상호 지원, 평화와 정의 증진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14] WFMUCW는 훗날 세계 감리교 및 연합교회 여성 연맹(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1년에는 김활란을 기념하여 젊은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헬렌 김 기념 장학금(Helen Kim Memorial Scholarship)을 제정하기도 했다.[2]
해방 이후에도 기독교 관련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다. 1946년에는 중화민국 항저우에서 열린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세계대회에 조선 여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였다.
1961년에는 금란전도협회를 조직하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복음 전파 활동에 힘썼다. 또한 대한기독교교육자협회 회장, 전국복음화운동 명예회장, 한국기독화운동위원회 위원장 등 기독교계의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아 활동했다. 1962년 이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인천, 포천, 충주, 부여, 원주, 전주, 대전, 신탄진, 대구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다.
김활란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여성 교육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그리고 기독교 복음 전파에 헌신했으며, 특히 여성 기독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4. 논란
김활란은 일제강점기 말기의 행적으로 인해 친일 인사로 지목되는 등 비판을 받았다. 2001년 <월간중앙> 8월호에서 공개된 '1948년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지목한 숙청대상 친일인사들의 명단 초안' 문건에 따르면, 김활란은 민족진영에 의해 숙청 대상 중 한 명으로 이름이 올랐다.[27] 그의 구체적인 친일 행적은 하위 문단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해방 이후에는 우파 정치 노선을 걸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에 참여하여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위원[26] 및 우익 여성단체인 독립촉성중앙부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1946년에는 민주의원 비서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민주의원 대표로 참석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독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1948년 남북협상과 단독정부 수립 논의가 분분할 당시에는 이승만을 지지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행보와 인식에 대해서는 하위 문단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
4. 1. 친일 행적
1936년 말부터 교육과 여성 계몽 분야에서 친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했다.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칼럼 기고와 강연 활동에 나섰으며, 1937년부터는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조선부인연구회, 방송선전협의회, 애국금차회 등에 참여했다.김활란은 김복수 등 상류층 여성들과 함께 애국금차회를 조직하여 금비녀와 금가락지 등을 모아 일제의 국방비로 헌납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선언론보국회, 조선임전보국단 등 친일 단체를 통해 수백 차례의 시국 강연을 진행했으며, 《동양지광》, 《조광》, 매일신보 등 당시 매체에 일본 제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내선 일체를 강조하는 내용의 선동적인 논설을 수백 차례 기고하며 일제 말기 전시 체제에 적극 협력했다. 나아가 일제의 한민족 말살 정책인 신사참배 강요에 동조하고, 징병제를 독려하는 강연에도 앞장섰다.
그녀의 주요 친일 발언 및 기고는 다음과 같다.[35]
- 1939년 6월 《동양지광》 - 부인들끼리의 애정과 이해 - 내선 부인의 애국적 협력을 위하여: "과거 조선의 부인운동은 어쨌든 화려한 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정말로 구호에 불과한 부끄러운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선 일체의 대업 속에서 정말로 확고하게 현실성이 있는 부인운동이 전개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1941년 12월 27일 - 여성의 무장(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결전부인대회): "저 흑노(黑奴) 해방(노예 해방)의 싸움을 성전이라 했고 십자군의 싸움도 성전이라 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은 정말로 내려진 것이다. 동아 10억의 민족을 해방하고 광명으로 인도하려는 도의의 전쟁이다. 우리 총후의 반도 여성은 지금 이 도의 전쟁에 한 사람의 투사로서 가담하고 있다는 광영(光榮)을 가졌다."
- 1942년 12월 - 징병제와 반도 여성의 각오: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중략)… 이제 우리에게도 국민으로서의 최대 책임을 다할 기회가 왔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진정한 황국 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이 감격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943년 8월 7일 매일신보 - 거룩한 대화혼을 명심 - 적 결멸에 일로매진: "이 기회에 대동아 건설을 위하여 동아 10억의 민족을 저 앵글로 색슨의 손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우리 황군이 도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때에 반도 청년에 이러한 영예를 내리옵심은 더욱 기쁜 바이며, 또한 행복된 일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배속으로부터 대화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 존엄하옵신 황실을 받들어 모시고 생사를 초월하여 대군을 위하여 순국 봉사하는 그 마음 오직 우리 황국 신민만이, 특히 제국 군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다."
- 1943년 12월 《조광》 - 뒷일은 우리가: "학병제군 앞에는 양양한 전도가 열리었다. 몸으로 국가에 순(殉)하는 거룩한 사명이 부여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제군은 오늘 이때를 영구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가라! 전선으로. 그 뒤는 우리가 맡겠다. 총후의 여성들은 제군들이 안심할 만큼 만사를 해내일 각오가 굳은 바이니, 바라건대 모쪼록 빛나는 전공을 세워 조선학도의 참다운 일면을 길이 청사에 빛내여라!"
- 1943년 12월 25일 매일신보 - 남자에 지지 않게 황국 여성으로서 사명을 완수: (1943년 전시교육임시조치령에 따라 이화여자전문학교가 폐교되고 '여자특별연성소'로 바뀐 것에 대해) "그러나 싸움이란 반드시 제일선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여자특별연성소 지도원 양성 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생도들도 황국 여성으로서 다시 없는 특전이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 1938년 6월 9일 매일신보 - 감격과 가중한 책임 - 진두에 나설 여학생의 결의: (조선 YWCA 회장으로서 일본 YWCA 가맹 발표하며) “비상시국에 있어 기독교 여자 청년들도 내선 일체의 깃발 아래로 모여 시국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황국 신민으로서 앞날을 자기(自期)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김활란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감리교 내 친일 부역자 명단 12명 중 평신도 3인(윤치호, 신흥우, 김활란)의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32]
이화여자대학교 교정 내에 설치된 김활란 동상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3월과 4월, 민주노동당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김활란의 친일 행적을 비판하며 동상 철거와 '김활란 상'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31][35][27]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화의 자랑스러운 선배는 친일파 김활란 초대총장이 아닌 이화학당의 재학생으로서 독립운동에 자신을 헌신한 유관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수첩에 김활란을 '이화의 뿌리'로 소개한 총학생회의 태도를 비판했다.[27] 이에 대해 당시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김활란 총장 수록이 '이화인의 뿌리찾기' 차원이며 역대 총장 중 한 명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친일 행적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27] 김활란의 친일 행위는 "혹독한 식민지 정책 하에서 이화학당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5], 그의 동상과 초상을 둘러싼 논란과 학생들의 항의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4][6]
4. 2. 여성관 및 사회 인식
김활란은 전국 여성 단체인 권우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잔존하는 봉건적 관습과 신앙, 그리고 식민 통치의 제약을 종식시키는 데 헌신했다.[4]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 및 사회주의자 여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 오래 참여하지는 않았다.[9] 이는 그의 여성 운동 노선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띠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1922년 한국 YWCA를 설립하고[6], 1923년부터 추진해 온 세계 감리교 여성 연맹(WFMUCW) 창립 헌장을 1939년 미국에서 채택하는 데 기여했다.[2]해방 이후, 김활란은 정치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뚜렷한 우파 및 반공주의 성향을 보였다. 1945년에는 장면, 오천석, 유옥겸, 백낙준 등과 함께 한국 교육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이념 수립에 관여했다.[10] 같은 해 김구 등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강력한 반탁 운동을 추진하자, 12월 30일 결성된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26] 1946년에는 우익 여성단체이자 독립촉성국민회 산하 조직인 독립촉성중앙부인단에 참여하여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1946년 2월에는 민주의원 비서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민주의원 대표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조선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 독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46년 중화민국 항저우에서 열린 여자기독교청년회 세계대회에 조선 여성 대표로 참석했다.
1948년 1월, 남북협상론과 단독정부 수립론이 대립하자 이승만을 지지하며 단독정부 수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 공보실장을 맡기도 했다.[4] 공보실장 재직 시 영어 신문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코리아타임스 창간에 기여했다.[11]
한편, 김활란은 친일 행적으로 인해 비판받기도 했다. 2001년 <월간중앙>이 공개한 '1948년 김구와 임시정부 계열이 지목한 숙청대상 친일인사들의 명단 초안'에 따르면, 김활란은 민족진영에 의해 숙청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27]
5. 평가
김활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엇갈린다.[36]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여성주의 확산에 공헌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내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교육계와 여성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기인 1936년 이후 대표적인 여성 친일파로 변절하여 전시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6] 이 때문에 임시정부 계열에서 1948년 작성한 숙청 대상 친일 인사 명단 초안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27] 또한, 자신의 제자들을 전쟁터로 보낸 인물 중 하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친일 행적 논란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5년 민주노동당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김활란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의 친일 행적을 비판하며 '김활란 상' 폐지와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활란 대신 독립운동가 유관순을 이화의 자랑스러운 선배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여성운동은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을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27] 또한 이화여대 학생수첩에 김활란이 '이화의 뿌리'로 소개된 점을 비판하며 총학생회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총학생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27]
이화여대 학생 모임 '이구동성' 역시 김활란이 '여성박사 1호', '여성운동의 선구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유관순 열사의 동상 건립을 주장했다.[37] 이들은 김활란의 과오는 철저히 비판하고 공은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37]
6. 상훈
- 교육부문 대한민국장(1963년)
-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 공익부문상(1963년 8월)
- 미국 감리교회에서 주는 다락방상[34](1963년)
- 사후 유엔 한국 대표로 오랫동안 활동한 공로로 1970년 일등수교훈장이 추서되었다.
7. 저서
참조
[1]
뉴스
DR. HELEN KIM, 71, KOREAN FEMINIST
https://www.nytimes.[...]
1970-02-12
[2]
웹사이트
History – 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https://wfmucw.org/a[...]
[3]
뉴스
Korea Times Leads 'Personal Journalism'
https://koreatimes.c[...]
2013-12-31
[4]
저널
Feminists Navigating the Shoals of Nationalism and Collaboration: The Post-Colonial Korean Debate over How to Remember Kim Hwallan
https://muse.jhu.edu[...]
2006-01-01
[5]
웹사이트
Helen Kim and Ed Hymoff
http://www.bu.edu/cg[...]
[6]
뉴스
Ewha Students Demand Ex-Leader Statue Down
https://koreatimes.c[...]
2013-05-31
[7]
뉴스
Dean of Girls College in Korea Speaks Here
https://newspaperarc[...]
1931-11-20
[8]
웹사이트
Helen Kim
http://c250.columbia[...]
Columbia University
[9]
서적
The Great Enterprise: Sovereignty and Historiography in Modern Korea
Duke University Press
[10]
서적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University of Hawai'i Press
[11]
뉴스
Helen Kim: Mother of the Korea Times
https://koreatimes.c[...]
2011-11-01
[12]
서적
Fighting for the Enemy: Koreans in Japan's War, 1937–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3]
웹사이트
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 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https://wfmucw.org/
[14]
웹사이트
About Us – World Federation of Methodist and Uniting Church Women
https://wfmucw.org/a[...]
[15]
의학
병사
[16]
웹사이트
김활란(金活蘭)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
2020-08-29
[17]
저널
[권종현의 교육희망] 사학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해도 어쩔 수 없다는 교육부?
https://www.vop.co.k[...]
민중의소리
2019-07-24
[18]
서적
이것이 한국 최초
삼문
1995-11-01
[19]
서적
한국사 100 장면
가람기획
[20]
서적
우남 이승만 연구
역사비평사
[21]
서적
송건호 전집 4
한길사
[22]
서적
송건호 전집 4
한길사
[23]
뉴스
장상씨가 변호하는 '김활란 친일행각'의 전모
https://news.naver.c[...]
프레시안
2002-07-30
[24]
뉴스
오시영의 세상의 창-김삼환 시인의 “따뜻한 손”, 참을 수 없는 역사 왜곡자들의 궤변
http://news.lec.co.k[...]
법률신문
2013-06-07
[25]
뉴스
언론사주·대학총장 등 일제말 지도층 치부 ‘낱낱이’
http://www.hani.co.k[...]
한겨레
2009-11-27
[26]
서적
아! 비운의 역사현장 경교장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27]
뉴스
이대 학생위 "친일파 김활란 동상 철거하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03-25
[28]
뉴스
건국외교, 감독 이승만, 주연 장면, 조연 바티칸-미국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2013-03-27
[29]
뉴스
歷代유엔總會韓國代表團
http://dna.naver.com[...]
경향신문
1962-08-08
[30]
일반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31]
뉴스
이대 학생위 "친일파 김활란 동상 철거하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03-25
[32]
뉴스
감리회, 교단 내 친일 인사와 독립운동가 명단 발표 - 광복 60주년 기념 예배 자료집 발간…친일 인사 선정 근거 없고, 교단 차원 친일은 빠져
http://www.newsnjoy.[...]
뉴스앤조이
2005-08-06
[33]
뉴스
혼돈의 해방공간서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다
http://news.donga.co[...]
동아일보
2008-08-22
[34]
뉴스
有色人으론 첫榮譽 = 金活蘭博士, 「다락방賞」 受賞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63-10-03
[35]
뉴스
이대 학생위, 친일파 김활란 동상 철거하라!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03-25
[36]
웹인용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논란
http://www.e2news.co[...]
2010-11-04
[37]
뉴스
"자랑스런 이대인은 김활란이 아닌 유관순"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5-06-1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