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식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민원식은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대한제국 시기에는 경무청 총순, 내무부 서기, 위생국장 등을 역임하며 일본의 지원을 받아 고속 승진했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참의가 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의 자치권과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며 일본 중의원과 귀족원에 청원 활동을 펼쳤다. 그는 3·1 운동을 비판하고, 일본 제국의 법률 내에서의 자치권 및 참정권 획득을 주장했으나, 1921년 도쿄에서 독립운동가 양근환에게 피습당해 사망했다. 그는 친일 행위로 비판받았지만, 참정권 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제국의 활동가 - 엄준원
엄준원은 대한제국 시기의 무관, 교육가, 친일파로, 무과 급제 후 관료 생활을 시작하여 한성부 판윤과 군부협판을 역임했으며, 진명여학교를 설립하여 여성 교육에 기여했으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으로 인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 - 대한제국의 활동가 - 이종린 (1883년)
이종린은 대한제국 말기 언론인, 개화기 문인, 사회운동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조선독립신문》을 발행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했으나,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과 한국 전쟁 중 납북으로 사망했다. - 반인종주의 활동가 - 월터 로드니
가이아나의 역사학자이자 활동가였던 월터 로드니는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저서를 남기고 정치 활동을 하다 폭탄 테러로 사망했으며, 그의 업적은 아프리카 해방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반인종주의 활동가 - 코넬 웨스트
코넬 웨스트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의 철학자, 작가, 사회 활동가, 공공 지식인으로, 진보적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미국의 인종, 정치, 경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 출혈로 죽은 사람 - 허버트 후버
성공적인 광산 기술자이자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구호 활동과 식량 관리에서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였던 허버트 후버는 상무장관을 거쳐 제31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나, 세계 대공황 시기에 비판을 받으며 재선에 실패했고, 이후에도 정치 및 저술 활동을 이어갔다. - 출혈로 죽은 사람 - 조 스피넬
조 스피넬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배우이자 각본가로, 영화 《대부》로 데뷔하여 덩치 크고 위압적인 외모로 범죄자 역할을 주로 맡았으며, 슬래셔 영화 《매니악》의 주연, 공동 각본, 공동 제작을 맡았다.
2. 생애
민원식은 경기도양평군 출신으로, 본래 민영휘의 아들이었으나 먼 친척인 민영우의 양자가 되었다. 1904년 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의 조카 엄채덕과 결혼했다. 1905년 대한제국경무청 총순이 되었으나 1년 만에 사직했다. 1906년부터 이토 히로부미, 하세가와 요시미치 등의 후원으로 빠른 승진을 거듭, 내무부서기를 거쳐 탁지부 주사,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로 내무부 위생과장, 참서관을 역임했다. 1907년에는 내무부 위생국장 겸 광제원장, 일본 궁내부 제실회계심사위원이 되었다. 1910년 1월 1일 시사신문을 창간했다.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참의가 된 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참정권, 자치권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다. 1911년 7월 경기도양지군수, 1914년 3월 경기도이천군수를 거쳐 1917년 9월 고양군수로 부임했다. 1919년 3·1 운동에 반대하며 매일신보 등에 비판 기사를 연재했다. 같은 해 11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참의로 복직, 3·1 운동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합법적인 자치권, 참정권 획득 운동을 주장했다.
1919년부터 일본의 중의원, 귀족원 등에 조선인 참정권을 청원했고, 1920년과 1921년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 정치인과 지식인들에게 조선인 참정권 지지를 호소했다. 서예가이자 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1921년 2월 16일, 도쿄 스테이션 호텔에서 양근환에게 피습, 2월 17일 도쿄 제국대학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양근환은 민원식의 참정권, 자치권 주장이 독립 운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진다.
2. 1. 대한제국 시기 ( ~ 1910년)
민원식은 조선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다. 친부는 민영준이었으나, 친척인 민영우(본명 민영옥)에게 입양되었다. 여흥 민씨 가문 출신으로, 명성황후와 순명효황후와는 먼 친척 관계였다. 1906년 10월 영월 엄씨 출신으로 고종의 후궁인 순헌황귀비의 조카 엄채덕과 결혼했다.1899년 동아어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1905년 2월 귀국하여 경무청 총순에 임명되었으나 1년 만에 사임했다. 일본의 한국 보호 통치 하에 이토 히로부미와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후원으로 1906년 7월 내부대신부 서기관, 1906년 8월 내부대신부 위생국 위생과장이 되었다. 그는 한국의 전염병 통제와 위생 개선을 위해 성병 검사를 의무화하는 국가 규제 매춘 제도를 도입했다.
1907년 3월 광제원 원장 직무대행, 1907년 4월 1일부터 25일까지 광제원 병원 원장을 역임했고, 내부대신부 위생과장 직을 겸임했다.
1910년 1월 1일 ''시사신문'' 사장에 취임했고,[1] 같은 해 친일 정치 클럽인 정우회에 가입했다.[2]
2. 1. 1. 출생과 가계
민원식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7월 12일에 태어났다.[10] 출생년도는 1886년생 설, 1887년생 설, 1885년생 설 등이 있다. 아버지는 민영준이며, 어머니는 전주 이씨이다. 그는 고려 인종 때의 문신 문경공 민영모(閔令謨)의 후손이었다.[10] 그러나 한때 그의 집안이 '비천한 가문이었다[11]'는 설이 돌기도 했다.그의 생가는 민영모의 손자인 민적균의 후손으로, 생부 민영준은 민적균의 22대손이며, 고려 말 공조전서를 지낸 민세영의 16대손이었다. 친형제로는 민윤식이 있었다.[13] 생부 민영준은 사헌부감찰, 선전관을 역임했다. 양아버지 민영우는 민영모의 다른 손자인 한림학사 민인균의 후손으로, 인현왕후의 친정아버지 민유중의 7대손이자 민진원의 6대손, 민형수의 4대손이었으며, 입양된 양아버지 쪽으로는 민정중, 민시중, 민진후, 민진장 등이 각각 종7대조와 종6대조가 된다. 양아버지 민영억은 비서원승을 지냈고, 양조부 민동호는 노성현감을 역임했다.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31일자 2면에는 민원식이 일시적으로 수감되자 부인 엄씨와 아버지 민영억이 면회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또 1918년의 매일신보 기사에는 그의 양부 민영우의 부고 기사가 나타난다. 생부 민영준은 당대의 권세가로 후일 민영익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민영준과 동명이인이었다. 명성황후와는 먼 일가간이었다.
2. 1. 2. 청년기와 수학
1894년에 중국 보정부로 건너갔다가 1897년 조선에 돌아왔다.[11] 1897년 그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속독했지만, 중국 지식이 실생활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얼마 못가 서당을 그만두었다. 이후 각지를 유랑하며 날품팔이와 행상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1898년 이후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11도를 떠돌다가 1899년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과 사귀었고 일본어를 익혔다. 한때는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동아어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조선어, 만주어, 한문 과목을 가르쳤다.[10]그는 동아어학교 교사 재직 시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카오루 등 지체높은 가문에 출입하고 있었다.[11] 당시 20세가 채 되지 않았던 민원식이 정계 요인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던 조선에 돌아 왔을 때, 이러한 오랜 일본 체류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11] 일본 체류 중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일본어 교사와 중국어 교사직이 추천되었지만 그는 답장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번번히 거절했다.
1905년 3월 2일 경무청 총순(警務廳總巡)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퇴했다. 같은 해 11월 일본에 체류하던 중 을사 보호 조약의 소식을 접한 그는 이후 실력 양성론을 주장하였다. 1906년 이래 그는 실력양성운동을 고창하며 친일활동을 하였다.[14] 그는 멸망 이전의 조선시대를 문벌의 구분과 신분제의 억압으로 인한 몽매·미개의 시대로 파악했다.[44] 비인간적인 신분 제도와 위계 서열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실력과 능력 보다는 문벌과 배경이 있어야만 출세할 수 있는 사회로 봤다. 그는 당시 조선의 지배계층과 지식인층이 모두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욕이 없다고 보고, 희망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1905년 4월 6일 다시 경무청 총순에 임명되고 판임관 6등(判任官六等)에 서임되었다.[15] 그러나 1906년 2월 21일 경무청 총순직을 사퇴했다.[16]
2. 1. 3. 관료 생활과 언론 활동
1905년 3월 2일 대한제국 경무청 총순이 되었다가 같은 해 3월 사퇴했다. 1905년 4월 6일 다시 경무청 총순에 임명되고 판임관 6등이 되었다. 1906년 2월 21일 경무청 총순직을 사퇴했다. 1906년 6월에는 협잡 혐의로 일시적으로 파면되어 경무청에 구금되기도 했다. 1906년 7월 내부 서기가 되었다가, 같은 달 탁지부 서무과 주사로 승진하여 판임관 7급이 되었다. 1906년 8월에는 내부 위생국 위생과장이 되었다. 1906년 9월 내부 참서관이 되었다.1907년 당시 일본 궁내성에 시찰 갔다가 일본인에 의해 유인되어 인종박람회에 끌려간 조선인 남녀를 보고 안타깝게 여겨,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8] 1907년 3월 승훈랑이 되고, 겸임 광제원장 서리가 되었다. 1907년 4월 통정대부로 승진, 내부 위생국장 겸 광제원장에 임명되었다. 1907년 4월 22일 궁내부 제실 회계 심사위원이 되고, 1907년 4월 25일부터 8월까지는 일본에 파견근무, 궁내성 사무시찰관을 역임했다. 1907년 6월 내부 서기관이 되었다. 1908년 5월 퇴직했다. 1907년 내무부 위생과장으로 재직 중 《위생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1908년 친일 인사 이지용 등과 함께 대한실업협회를 조직했다. 1909년 10월 대동일보사(大同日報社) 사장에 추천되었다. 1909년 10월 24일 국시유세단(國是遊說團)의 기관지 대동일보의 사장에 선임되었다.[35] 1909년 11월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과 송덕비 등의 설립을 추진하던 동아찬영회에 가입, 동아찬영회 창립발기위원, 동아찬영회 간사 등에 선임되었다. 1909년 12월 18일 백락균과 자본금 1500원을 적립하고 신문 발간을 내부에 청원했으며, 12월 24일 사장에 추대되었다.[35]
1910년 1월 1일부로 시사신문을 정식 창간하고 대표에 취임하였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지신보에서 힌트를 얻어 신문 이름을 시사신문이라 했다. 시사신문은 1910년 11월 1일부로 폐간되었다가 1919년 이후 다시 간행한다. 1910년 3월 29일 이재극, 고희경, 정응고, 고희준 등 100여 명과 함께 정우회를 조직하고 위원이 되었다. 1910년 8월 27일 가의대부가 되었다.
1910년 10월 1일 한일 합방 이후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었다.
2. 2. 일제강점기 (1910년 ~ 1921년)
일제강점기 초, 민원식은 조선인의 참정권과 자치권을 주장했다. 1907년 일본 궁내성 시찰 중 인종박람회에 끌려간 조선인 남녀를 보고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기도 했다.[8] 1906년 이토 히로부미의 후원으로 내무부 위생국 위생과장, 통정대부 등을 역임했고, 1907년에는 《위생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1908년에는 친일 인사 이지용 등과 대한실업협회를 조직했고, 1910년 1월 1일에는 《시사신문 (時事新聞)》을 발행하여 사장에 취임하였다.한일 병합 이후, 민원식은 중추원 부찬의를 역임하며 이규완 등과 함께 조선인의 참정권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1919년에는 3.1 만세 운동을 비판하고, 민족자결주의를 오해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1920년, 조선총독부가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문화 정치로 정책을 바꾸면서 민간신문 발행이 허용되자, 민원식은 신일본주의를 표방하며 조선인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같은 해 국민협회(國民協會)를 조직하고, 4월 1일에는 《시사신문》을 복간하였다.
1921년 2월 16일, 일본 도쿄 데이고쿠 호텔(帝國 Hotel)에서 목수로 위장한 민족주의자 양근환에게 피습당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으로 3.1 운동 이후 나타난 민원식 등의 참정권 운동은 일단락되었다.[9]
2. 2. 1. 조선총독부 부찬의와 군수 시절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었다.[30] 1911년 7월에는 조선총독부 군수로 임용되어 경기도 양지 군수가 되었다.[30]양지군수 재직 시절, 우사미 카츠오(宇佐美騰夫) 조선총독부 내무부 장관의 지도로 일본의 모범 부락 7개소를 방문하였다.[41] 특히 시즈오카현 안바라(菴原) 촌에서는 메이지 시대 초기 독지가인 가타히라 노부아키(片平信明)가 시작했던 호토쿠샤(報德社) 운동이 보급되어, 근로·저축·납세 관념이 지역민들에게 철저하게 인식된 것에 감명을 받았다.[41] 귀국 후 그는 자신이 부임한 곳에 야학당을 설치하여 문맹을 없앴고, 부임지 군민들에게 저축과 절약을 강조하였다.[41]
그는 총독부 고관과 친분을 쌓는 한편, 일본의 지방개량운동과 그 기반이 되었던 호토쿠샤 운동을 현지에서 관찰하고, 자신의 임지에서도 그것을 실천하려 하였다. 민원식이 생각한 그림은, 촌락의 유력자가 총독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교육·산업의 근대화를 추진하고, 촌락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담당해가는 모습이었다.[42]
1913년 7월 양지군 군수에 유임되었으며, 1913년 12월 13일 고등관 7등으로 승급하고,[43] 1914년 3월 종7위로 승서되고, 경기도 이천 군수로 발령받았다. 지방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세 감면을 경기도와 조선총독부에 건의하여 성사시켰으므로 명관이라는 평을 들었다. 1915년부터 1917년 7월까지 경기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지냈으며, 1917년 9월 정7위로 승서되고, 고양 군수로 부임하였다. 고양군수 재직 중 1918년 12월 대정친목회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대정친목회 이사가 되었다.
1919년 11월 고양군수직을 사임하였다.[30]
2. 2. 2. 3.1 운동 전후와 참정권 운동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소요의 원인과 광구 예안을 발표하고,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조선 소요에 관해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3.1 운동은 조선인의 민족적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와 천도교 신도들이 민족자결주의를 오해한데서 발생한 망동이라 주장했다.[44]3·1 만세 운동 직후, 그는 3·1운동은 민족자결의 새 용어를 오해한 데서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망동이고, 현 상태에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선 민족은 일본 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헌을 존중하고 국법을 준수하며 개인 독립의 실력을 양성하자고 주장하였다. 4월 그는 "소요의 원인과 광구예안(匡救例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 1919년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 발표하면서 3·1 운동 당시의 혼란과 소요 사태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4월 말에 또 다시 다시 소요에 대해라는 글을 경성일보에 게재하였다. 그는 '선각자의 분려(奮勵)를 망(望) 함', '소요의 원인과 광구 사안(光救私案)', '갱(更)히 소요에 대하여'라는 글을 매일신보에 잇달아 연재했다.[44]
1919년 10월 19일과 10월 21일자 경성일보에는 신일본주의를 기고해 3.1 만세 운동과 같은 저항운동을 막으려면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방법으로 신일본주의를 제창했다. 이 글에서 그는 당대의 수준으로 조선 민족만으로 조직된 독립국가는 개인 생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최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으며 한일 병합으로 새롭게 창설된 일본 제국(신일본)만이 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조선인은 신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노력으로 여러 권리를 획득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무력,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력 양성을 통하여 우리가 자치권과 참정권을 획득할 것을 거듭 역설하였다. '동화주의적 입장에서의 실력양성론'은 1919년 3.1 운동 직후 민원식의 글에도 나타난다.[45] 민원식은 다른 사람, 다른 집단에 대한 배척과 폭력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으며, 퇴보, 수구, 정체 현상만이 나타나 자멸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를 것이라고 했다.
3.1 운동 당시 그는 매일신보에 연재물을 실어 3.1 운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46] 그는 독립 이전에 교육을 장려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였다. 민원식은 명백하게 한국인도 당국의 지도하에 지력, 부력 등 실력을 양성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를 '내지인'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47]
그는 성명과 벽보를 통해 미신적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할 것을 피력하였다. 민원식은 한편으로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사령부에 대해서도 조선인에 대한 무조건적 공격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3.1 만세 운동이 조선인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1919년 민원식은 신일본주의를 표방하고 일본 중의원에 의원선거법의 조선 시행을 청원하였다.[48] 또한 한편으로 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참정권과 자치권을 얻어낼 것을 호소했다. 그는 또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거둘 것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 행정 제도를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할 것, 조선인에게 일본 국회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할 것'이 그것이었다. 민원식은 이것이 곧 3·1 운동을 진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이라고 보고 있었다.[49] 그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나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 일본 통치에 대한 반감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3.1 운동 직후의 일이라 민원식의 친일 행동은 조선 민중의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48] 그해 7월 교풍회 경성지회 고문에 선임되었다.
1919년 8월 1일 협성구락부(協成俱樂部)를 재조직하고 발기인이 되었다.[50] 여기에는 그의 조선인 참정권 운동, 지방 자치자치권 운동에 공감한 김명준, 한영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어 그는 회장으로 추대[50] 되었다.
1919년 11월 고양군 군수직을 사퇴하자 종6위로 승서되었으며, 다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성토의 대상이 됐다. 3.1 운동 당시 살포된 전단에는 반(反) 3.1 운동 논설을 쓰는 자들에 대한 규탄의 소리가 담겨 있었다.[49] 11월 27일 대한인국민회 계열의 재미교포 언론 신한민보는 "마땅히 죽어야 할 민원식"이라는 규탄 사설을 실었다.[51] 고양군수에서 퇴직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을 방문, 일본 조야와 각계의 지식인들을 찾아다니며 조선인 참정권을 허용해줄 것을 설득하였다.
1919년 8월 심천풍, 이기찬 등 친일관료 출신들이 하라 수상에게 조선 의회 설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같은 해 말 민원식은 참정권 부여를 다시 주장했다.[53] 당시 청원운동의 지도자는 민원식이었다.[54] 11월 28일 그는 경성부 부부윤(副府尹)의 직에 천거되었지만 스스로 고사하였다. 이후 그는 일본 본국 정부와 일본 국회에 조선인의 일본 정부 참정권, 자치권, 투표 출마 허용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에 일본이 조선을 같은 국민으로 인정한다면 참정권을 주어야 한다고 반복했다. 참정권과 선거권을 부여하여 일본 제국의 정치에 참여하고, 지방 행정기관과 의회, 중의원에 입후보, 출마할 기회를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며 그것이 조선인들 스스로가 일본의 국민이라 확신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독부와 내각에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당시 조선의 정관계 인사들과 구 귀족, 지식인 청년들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사람을 파견, 일본 정부에 보낼 조선인 참정권 연명부에 서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작위와 중추원 참의직에 있는 조선인 관료들 조차도 민원식의 참정권 서명을 회피했다. 이후 국민협회는 중의원 선거법을 조선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1920년 1월과 7월, 1922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제국 의회 중의원에 제출하고 1922년 이후에는 역대 내각에 같은 취지의 건백서를 계속 제출해 갔다.[55]
1920년 1월 16일 김영한(金榮漢), 민원식 등은 친일본주의를 주장하고 '유교진흥회(儒道振興會)'를 조직하였다.[56] 그는 조선인이 곧 일본인이므로 일본인으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했다.[54] 또한 징병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환영을 표명하며 그 보상으로 참정권 부여를 요구했다.[54] 그러나 총독부 측에서는 시기상조라 답하였다.
1920년 7월 민원식은 참정권 청원서를 들고 도쿄로 건너갔다.[57] 소요선후책으로 참정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57] 그 후 지방 자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성부 부협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20명 외에 국민협회 몫의 부협의회 의원 후보로 우전석태랑(隅田石太郞), 교본무웅(橋本茂雄), 관자태랑(關繁太郞), 소빈근팔(小杉謹八), 최진, 박승빈 등을 추천하였다.[58]
1920년 흑룡회에서는 선전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민원식, 구주(葛生能久, 葛生修亮과 동일인, 흑룡회 간사) 공저로 《조선통치문제 (朝鮮統治問題)》(1920)를 출판하였다.[59]
3.1 운동의 진압 이후 그는 '조선에 자치권과 참정권을 줄 것을 요구하는 자치 운동'을 전개하였다.[60]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문화정치로 정책을 바꿔 민간 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자 신일본주의를 표방하며 조선인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해 자신이 조직했던 협성구락부(協成俱樂部)를 개편하여 국민협회(國民協會)를 조직하였다. 그해 4월 1일에는 신문을 복간, 《시사신문 (時事新聞)》을 다시 재간행하고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때 그는 부사장에 김명준, 주간에 이동우(李東雨), 편집주임에 김환(金丸), 경리주임에 방한복(方漢復) 등으로 구성하여 민족주의 진영의 김성수, 송진우, 이상협(李相協) 등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등에 반대 논조의 기사, 사설을 실었다.
민원식은 시사신문 사장을 역임하면서 조선 독립을 “폭거”라고 선언하기도 했다.[61]
그는 조선이 현실적으로 무력으로 일본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본 정부를 상대로 참정권과 자치권을 얻어낼 것을 역설했다. 1921년 1월 조선인의 참정권 청원을 목적으로 참정권 청원서를 소지하고 일본을 방문한 민원식은 도쿄 스테이션 호텔에 체류하다가 데이고쿠호텔(帝國 Hotel)로 이동했다. 당시 그는 국민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정권 청원운동을 위해 도쿄로 가서 105명의 연서로 청원서를 일본 국회의 하원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그가 일본에 온 이유는 조선의 융화책을 위해 내지인과 같은 참정권을 조선인에게 부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여 일본 참의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62] 그는 계속 도쿄의 호텔에 머무르면서 청원서를 인쇄하여 귀족원과 중의원에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는 한일 병합 직후부터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줄 것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 정부에 여러번 탄원하였다. 민원식은 1920년 1월 18일에 국민협회(國民協會)를 결성하고 신일본주의를 제창하면서 조선의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국민협회 명의로 2월 5일에 100여 명이 서명한 중의원 선거법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올렸다.[76] 그는 일본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대제국이 되려면 식민지, 내지를 차별하지 말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의회 의원을 선출할 투표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다.
1919년 11월과 12월 그는 일본을 방문하여 중의원 의원들과 지식인들을 상대로 조선인에게 참정권과 투표권 부여의 당위성을 설득하였다. 조선인에게 어떠한 권리, 권한도 주지 않고 계속 차별한다면 조선인들의 반발은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그의 견해를 터무늬없는 주장이라 일축했으나, 일부 지식인들은 그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고 그의 여비와 호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1920년 6월에도 그는 600여 명이 연서한 청원서를 일본 귀족원·중의원 양원에 제출하였다.[76] 1921년 2월에는 3,000여 명이 연서한 청원서를 갖고 제43회 일본의회에 제출하려고 일본에 건너갔다.[76]
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참정권과 자치권을 얻어낼 것을 호소했다. 민원식에 따르면 청원 운동은 두가지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했다.[49] 지방 행정 제도를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할 것, 조선인에게 일본 국회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할 것이 그 것이었다. 민원식은 이것이 곧 3·1 운동을 진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책 이라고 보고 있었다.[49] 그리고 조선인도 노력하면 일본 제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조선 총독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의 장관과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1919년 3.1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원식은 3.1 만세 운동이 조선인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사령부에 서한을 보내 3.1 만세 운동이 전 조선인의 일치단결된 뜻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도 아니라면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한해서만 처벌할 것을 탄원하였다. 민원식은 3.1 운동이 전 조선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줄 것을 지적했다.
민원식은 3.1 운동이 일어나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소요의 원인과 광구 예안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는 비슷한 주제를 다룬 조선소요에 관해서 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일부 조선인의 견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 민원식은 3.1 운동은 조선인의 민족적 운동이 아니며, 기독교와 천도교 신도가 민족자결의 신어(新語)를 오해한 데서 발생한 망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 2. 3. 피살
1921년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도쿄 데이고쿠 호텔 14호실 입구에서 목수로 위장한 민족주의자 양근환에게 칼을 맞아 살해당했다. 당시 자신을 목수라고 소개한 일본 옷차림의 청년이 그를 방문, 대화 도중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이 때에 참정권 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국노짓"이라면서 논쟁을 벌이다가 소지한 칼로 그를 찔러 중태에 빠뜨리고 도망쳤다.[64]소리를 듣고 달려온 호텔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는 도쿄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그는 복부와 이마를 여러 방 찔렸다. 곧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와 비슷한 행적을 봤다는 타바타 지역의 제보가 들어왔다. 양근환이 머물렀던 타바타의 이시와카 소노신(石川倉之進)의 하숙집도 수색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민원식이 위독하다는 보고가 일본 국왕에게 도달되었는데, 일왕은 특지로 그를 정5위 훈4등에 서하고 중추원 찬의를 수여하였다.
2월 17일 오전 도쿄제국대학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2월 18일 그의 피습 사망 소식을 듣고 부인 엄채덕, 장인 엄준원, 국민협회 총무간사 5명, 총독부 순사 등이 도쿄로 건너가 그의 시신을 확인하고 2월 19일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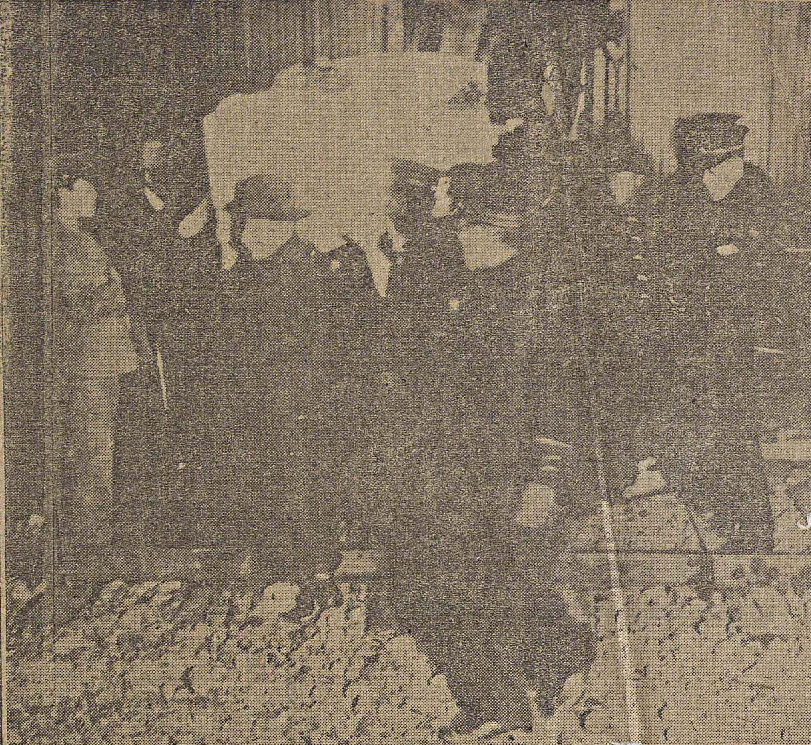
그를 찌른 양근환은 피습 후 상하이로 탈출하려다가 나가사키 항에서 나가사키 경찰에 체포되었다.[65] 양근환은 2월 24일 체포되어 5월 4일에 1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66] 이 사건으로 학우회의 간부들과 개벽사 동경지사의 방정환과 박달성 등도 연행되었다.[66] 양근환은 그해 8월 2일 동경지방법원 최종 공판에서 무기 징역 언도를 받았다.[67] 시신은 2월 19일 저녁 7시 50분경 일본을 출발, 2월 21일 경성부 남대문에 도착하였다. 2월 19일 귀국한 그의 처 엄채덕, 장인 엄준원, 친족 민영대 등 일가친속 외에 조선총독부 측 대표로는 중추원 서기관장 송영무길(松永武吉)이 수원으로 가서 시신을 영접하였다.
중의원에서는 그의 피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만장일치로 그의 청원을 채택하여 조선 사회에서는 그 귀추가 이목을 끈 바 있었으나, 일본은 조선에 이른바 참정권을 줄 생각이 없었다.[48] 민원식을 암살한 양근환은 자신은 목수라고 주장하고 빠져나왔지만, 그의 움직임을 이상하게 본 일본인 형사에 의해 체포되어 사건을 자백받았다. 일본 정부는 민원식이 중상을 입자 훈4등의 훈장을 서훈하고 중추원 찬의에 임명하였으며, 사망한 뒤에는 전국적으로 추도회를 열고 묘지는 총독부와 사회단체의 성금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순종은 어사를 도쿄로 보내 그의 빈소를 위문하고, 사망 소식을 접하자 순종은 다시 어사를 파견하여 향화료(香華料)를 내렸다. 한편 하라 수상, 사이토 마코토 총독, 미즈노 정무총감 등이 화환을 보내왔다.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 제독 등은 그가 신념에 따라 죽었다고 추도했다. 일본 정계에서도 민원식이 사망하자마자 이틀 후인 2월 18일 중의원 의원 요코야마(橫山勝太郎) 등 32명의 의원이 "민원식 객사에 관한 질문 주의서(質問主意書)를 의장에게 제출하였다.[68] 이들은 "민원식은 온건한 친일주의의 신사로서 소위 완미(頭迷)한 불령선인이 동군 등 의 신변에 위협을 가 하였다. ... 본 의원 등은 과격한 불령선인에 대한 엄중한 취체를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일한 합병의 취지를 헤아리고 일선 공존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친일주의의 인사에 대해 주도 면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물었다.[68] 그의 빈소에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 내무부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유가족을 위문하고 추모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인 참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과 일부 일본 정관계에서 3.1 만세 운동, 상하이 임시정부 등의 존재의 이유를 들어 조선인에 대한 불신, 반발 여론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였다.
그의 죽음으로 그가 운영하던 《시사신문》은 일시 혼란에 빠졌다가 나중에 명칭을 고치고 월간으로 《시사평론 (時事評論)》으로 이름을 바꿨다. 한편 1921년 9월 전 국민협회 간사 정필화(鄭弼和)는 상하이에서 행방불명되었는데, 독립단에 의해 암살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69] 회장과 간사를 연이어 잃은 국민협회는 한동안 혼란에 빠졌다. 국민협회는 임시로 김명준의 회장 대행 체제로 갔다가 김명준이 회장이 되었다.
일본 조야에서 민원식의 죽음을 신념 때문에 죽은 순절이라 하자 윤치호는 호들갑이라고 조롱했다. 윤치호는 "도쿄와 조선의 일본인들이 모두 민원식의 죽음에 대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그를 주의(主義)의 순절사(殉節士)라고 치켜세우면서 영웅시한다[46]"고 지적하였다. 윤치호는 민원식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소하였다. 윤치호는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민원식이 주의의 순절사로서 추도되고 영웅시되어야 한다면, 최근 2년 동안 자신들이 주의라고 여기는 것에 모든 걸 - 상당수는 자기 목숨까지 - 내 걸었던 수백 명의 용감한 3.1 운동 소년 소녀들이야말로 민원식보다 더 고결하지 않은가?[70]"라고 조소하였다. 일각에서는 민원식의 죽음을 살신성인이라 하자 윤치호는 3.1 운동 당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순수한 마음으로 만세에 참여한 학생들은 뭐냐면서 반박하였다.
3. 사상
민원식에게 일본은 장애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용하거나, 또는 도움을 청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38] 그는 "나의 지금이 있는 것은 일본 정부 및 일본인의 비호를 받은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는데, 이는 소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일본에 머물렀던 경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38]
그는 3.1 운동 당시 만세 운동만으로는 조선이 독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원식의 반(反) 3·1 운동론은 식민지 문명화론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44] 그는 멸망 이전의 조선 시대를 문벌의 구분과 신분제의 억압으로 인한 몽매하고 미개한 시대로 파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총독부가 정치를 펼친 이래 조선에서 비로소 법치주의와 문명화 과정이 시작됐다고 한다.[44] 조선 시대에는 지배층도 부패했지만, 민중들 역시 우매하였고 판단력이 결여된 채 구습과 미신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이 독립하더라도 서구의 민주주의 사상이나 일본의 문물, 가치를 학습하지 않는 한 다시 미개한 시대로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인들 스스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한 프랑스인, 찰스 1세를 처형한 영국인, 찰스 2세를 몰아낸 무혈 혁명과 같은 역사가 없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일본의 조선 병합이 일본의 영토 팽창 욕구뿐만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를 근대화하려는 뜻도 함께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이유는 낙후된 조선을 문명화하려는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는 논리였다.[44] 1910년 10월 1일 한일 합방 직후부터 그는 꾸준히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 정부를 상대로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일본이 조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조선인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인과응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일본인의 조선인 차별에 분개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차별대우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49]"고 말했다. 왜냐하면 양자 사이에는 경제력과 학력 수준에서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차별 대우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이다.[49] 또한 조선인 스스로가 지적 능력과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고, 사리판단보다는 낭설과 미신에 의존하는 것을 차별대우 받을 수밖에 없는 점으로 지적했다. 다시 말해 문명화 정도의 차이가 차별을 낳는 원인이라고 보았다.[49]
그는 독립 이전에 조선인들 스스로 실력을 양성할 것을 역설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는 조선이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위정자에서부터 천것에 이르기까지 타락하지 않은 자가 없다 하고, 분별력을 갖춘 인간이 되도록 스스로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원식은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차별 대우를 없애는 처방으로서 실력 양성론을 제시했다.[49] 조선인은 문명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력과 학력을 조속히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49] 그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하여 창고가 넉넉해야 남을 배려하는 인심이 생겨남을 지적하기도 했다.
1919년의 3.1 운동에서도 그는 조선이 독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우드로 윌슨은 미국인이지 조선인이 아니며 조선의 독립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민원식에 따르면 조선 독립은 불가능했다.[49] 민도와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단순한 감정으로 우르르 몰려나온 것으로 보았다. 미신과 구습에 젖어있는 조선인 자신들의 문제점은 판단하지 못하고 일본인의 차별 대우와 멸시에만 울분을 느껴서 그런 것으로도 보았다.
그는 만세 시위 운동이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터져 나온 것으로 이해했다.[49]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민족 자결주의는 조선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은 패전국 식민지가 아니라 승전국 일본의 '국내'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민원식은 승산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선 독립 요구를 접어두고 일본 제국의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조선인의 민권 향상을 위해 실력 양성 운동과 청원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49] 그는 강연과 논설을 통해 각종 민란이나 흉년이 들면 가족도 버리고 도망가거나, 도적이 되는 것을 설명하며, 스스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은 스스로 힘써 할 것이며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일 합방 직후부터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줄 것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제국 정부에 여러 번 탄원하였다. 민원식은 1920년 1월 18일에 국민협회를 결성하고 신일본주의를 제창하면서 조선 의회 설치를 주장하였다. 국민협회 명의로 2월 5일에 100여 명이 서명한 중의원 선거법 시행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올렸다.[76] 그는 일본이 다민족으로 구성된 대제국이 되려면 식민지, 내지를 차별하지 말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의회 의원을 선출할 투표권, 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1919년 11월과 12월 그는 일본을 방문하여 중의원 의원들과 지식인들을 상대로 조선인에게 참정권과 투표권 부여의 당위성을 설득하였다. 조선인에게 어떠한 권리, 권한도 주지 않고 계속 차별한다면 조선인들의 반발은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그의 견해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일축했으나, 일부 지식인들은 그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고 그의 여비와 호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1920년 6월에도 그는 600여 명이 연서한 청원서를 일본 귀족원·중의원 양원에 제출하였다.[76] 1921년 2월에는 3,000여 명이 연서한 청원서를 갖고 제43회 일본 의회에 제출하려고 일본에 건너갔다.[76]
그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참정권과 자치권을 얻어낼 것을 호소했다. 민원식에 따르면 청원 운동은 두 가지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했다.[49] 지방 행정 제도를 일본 본국과 동일하게 할 것, 조선인에게 일본 국회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할 것이 그것이었다. 민원식은 이것이 곧 3·1 운동을 진압할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이라고 보고 있었다.[49] 그리고 조선인도 노력하면 일본 제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조선 총독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의 장관과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식민지 백성에게도 참정권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무조건 식민지 백성들의 반란, 반발만을 의심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에 한해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식에 의하면 모든 조선인이 일본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대세에 따라 순응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920년 2월에 제출한 참정권 청원에서 그는 일본의 조선 지배가 불안정해진 이유를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은 데서 찾았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조선인이 한일 병합으로 일본 제국의 국민이 되었는데도 일본은 조선인에게 헌법상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갖지 못해 국가 관념이 결핍되었다고 보았다. 또, 그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싸움, 분쟁이 발생하면 일본인을 배려하는 것 역시 조선인이 반일 감정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인에게 일본 국민이라는 자각을 환기시키고 흩어진 민심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이며, 이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대본(大本)으로서 조선인 동화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조선인 참정권 운동은 점차 조선인 지식인들 일각에서 호응을 얻기 시작하였다. 민원식이 설립한 국민협회는 그의 사후에도 매년 그의 기일과 매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를 향해 조선인 정치 참여를 요청하였다. 1925년에 일본 정부에서 거절 의사를 보였으나 국민협회의 청원서와 편지는 계속 접수하였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에 조선인 자원 입대가 증가하면서 조선인 참정권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한때 국민협회가 1938년 '시국을 감안하여 이것(건백서)의 송부와 도쿄에서의 진정 운동을 중지하고 연맹에 가맹해서 오로지 시국에 대한 활동을 하기로 했다.[77]'며 한때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원도 '다수 유지에게 동의 도장을 구하는 등의 대대적인 활동은 그만두고, 일본인·조선인 도회 의원 등에 의한 비교적 소수의 청원으로 변했다.[77]' 소수의 일본인, 조선인 도회 의원 등의 청원서는 1945년까지 개인 명의로 계속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로 발송되었다.
그는 주민 자치권을 건의했고, 정부 시책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정부는 주민의 행정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이 정치, 행정, 사법 등에 적극 참여하여 각자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반역이나 정부 전복 외에는 허용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의 자치론은 일부 수용되었는데, 1910년 10월 2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 설치한 부군면협의회나 도 평의회는 1920년 7월부터 주민의 선거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1919년 3.1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원식은 3.1 만세 운동이 조선인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군 사령부에 서한을 보내 3.1 만세 운동이 전 조선인의 일치단결된 뜻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도 아니라면서 조선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한해서만 처벌할 것을 탄원하였다. 민원식은 3.1 운동이 전 조선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줄 것을 지적했다.
민원식은 3.1 운동이 일어나자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 소요의 원인과 광구 예안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는 비슷한 주제를 다룬 조선 소요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는 일부 조선인의 견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글에서 민원식은 3.1 운동은 조선인의 민족적 운동이 아니며, 기독교와 천도교 신도가 민족자결의 신어(新語)를 오해한 데서 발생한 망동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4. 평가
민원식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의 참정권 및 자치권 운동을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
- 민원식을 암살한 양근환은 그를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이 때에 참정권 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국노짓"이라고 비판했다.[65]
- 독립운동가 겸 사학자 신채호는 그의 주장을 '광론'이라 칭하며, 조선혁명선언에서 "3.1운동 이후에 강도 일본이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완화시키려고 송병준, 민원식 등 열두 매국노를 시키어 이따위 광론을 부름이니, 이에 부화하는 자는 맹인이 아니면 어찌 간적(奸賊)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87]
- 백남운은 1927년에 쓴 "조선 자치운동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에서 민원식의 자치론을 비판했다.[88]
-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 독립운동으로 보는 시각
- 만주와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김규면은 비망록에서 민원식을 독립운동가로, 그의 단체를 독립운동단체로 보았다.[63] 김규면은 그의 활동을 '어리석고 비루한 운동[63]'으로 평가하면서도, 독립운동의 하나로 해석했다.
- 민원식의 참정권 주장 운동이 1920년대 민족개량주의 운동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83]
- 기타 평가
- 윤치호는 민원식의 정치 노선에 공감하지 않지만, 그가 죽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치호는 "민원식을 한 인간으로서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그의 정치 노선에 공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가 죽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생각은 조선이 독립을 팔아넘기자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최상의 이익을 얻자는 것이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46]
- 일본 정계는 민원식 피살에 충격을 받고 그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일본은 조선에 참정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48]
-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 등은 민원식이 신념에 따라 죽었다고 추도했다.[68]
- 윤치호는 민원식의 죽음에 대한 사회 분위기를 조소하며, 3.1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용기를 더 높게 평가했다.[70]
1940년 조선총독부 주도로 조선인 참정권이 논의되면서, 민원식은 선각자로 추모되기도 했다. 1945년 3월 31일에는 조선인 참정권 허용을 기념하여 추도식이 열렸다.[74]
5. 가족 관계
6. 기타
민원식의 참정권 청원 운동은 일본인 또는 조선총독부의 사주를 받았다는 견해가 있다. 당시 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 鶴吉)의 조종 아래 참정권 청원운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이 있다.[89]
민원식 암살 사건은 "M사건[66]"으로도 불린다. 민원식을 살해한 양근환의 체포 소식을 들은 윤치호는 1921년 2월 일기에 "젊은 사람이 하찮은데 자기 목숨을 내놓다니 정말 유감스럽다. 암살 따위를 통해 조선 독립을 쟁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91]"라고 적었다.[90] 윤치호는 민원식을 암살한 양근환에게도 동정적이었다.
3.1 운동에 반대하는 가장 체계적인 논설을 발표한 친일 관료는 아마도 고양 군수 민원식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완용이 귀족계를 대표했다면, 민원식은 관료계의 선봉장이었다.[44]
참조
[1]
뉴스
밤의 일제 침략사
http://legacy.www.ha[...]
The Hangyoerye
2004-11-12
[2]
뉴스
'친일파' 고희준 전 거제군수의 굴절된 삶
http://www.ohmynews.[...]
Ohmynews
2003-07-13
[3]
뉴스
김선흠 등 매일신보•시사평론 간부 8명 친일 규명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07-12-12
[4]
뉴스
총독부 드나들며 정보보고 후 기밀비 챙겨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4-07-20
[5]
간행물
양근환 (梁槿煥) (Yang Geun-hwan)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4-08-31
[6]
뉴스
5월의 독립운동가 양근환 선생
http://news.donga.co[...]
The Dongah
2009-05-01
[7]
간행물
민원식 (閔元植) (Min Won-sik)
https://encykorea.ak[...]
Academy of Korean Studies
2024-08-31
[8]
서적
매천야록
서해문집
2006
[9]
서적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비한국학연구총서 1
역사비평사
1997
[10]
서적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02-01
[11]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4
[12]
문서
민영휘로 개명한 민영준과는 동명이인이다.
[13]
문서
민윤식은 1945년까지 생존해 있었다.
[14]
서적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비한국학연구총서 1
역사비평사
1997
[15]
뉴스
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905-04-11
[16]
뉴스
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906-03-03
[17]
간행물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서울대학교사학회, 서울대 국사학과
1998
[18]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19]
뉴스
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906-10-05
[20]
서적
한국영화의 쟁점과 사유
문예마당
1997
[21]
간행물
대한제국기의 "기생단속령", "창기단속령"
서울대학교사학회, 서울대 국사학과
1998
[22]
문서
성매매 여성에게 징수하는 세금
[23]
서적
청소년을 위한 한국과학사
두리미디어
2007
[24]
서적
역주매천야록, 2권
문학과지성사
2005
[25]
서적
역주매천야록, 2권
문학과지성사
2005
[26]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27]
서적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2005
[28]
뉴스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
1907-05-08
[29]
뉴스
國債報償義務金集送人員及額數
황성신문
1907-05-24
[30]
뉴스
서임급사령
황성신문
1907-11-23
[31]
서적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36권
국사편찬위원회
1994
[32]
서적
근대격변기의 상인 보부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3]
서적
근대격변기의 상인 보부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4]
서적
한국정치론
도서출판 오름
2004
[35]
서적
한국신문 한세기:개화기편
푸른사상사
2002
[36]
서적
한국신문 한세기:개화기편
푸른사상사
2002
[37]
서적
한국신문 한세기:개화기편
푸른사상사
2002
[38]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39]
서적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역사비평사
1998-11-05
[40]
서적
실록 친일파
돌베개
1991-02-01
[41]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42]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43]
신문
判事及郡守陞等
매일신보
1913-12-13
[44]
간행물
역사와현실, 69호
역사비평사
2008
[45]
서적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46]
서적
윤치호 일기:1916-1943
역사비평사
2002
[47]
서적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48]
서적
송건호전집 4:한국현대사 2
한길사
2002
[49]
간행물
역사와현실, 69호
역사비평사
2008
[50]
간행물
역사와현실, 69호
역사비평사
2008
[51]
신문
마땅히 죽어야 할 민원식
신한민보
1919-11-27
[52]
신문
3씨 送別會
매일신보
1919-12-11
[53]
서적
식민지 조선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에디터
2003
[54]
서적
우리는 조센진이 아니다
서해문집
2004
[55]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56]
서적
3.1 운동사 증보판
국학자료원
2004
[57]
서적
한국사 이야기 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2004
[58]
신문
出馬確實한 후보자
매일신보
1920-11-04
[59]
서적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2002
[60]
서적
거인의 숨결
동아일보사
1990
[61]
웹사이트
김선흠 등 매일신보·시사평론 간부 8명 친일 규명
http://www.mediatoda[...]
2007-12-12
[62]
서적
사랑의 선물: 소파 방정환의 생애
한림출판사
2005
[63]
서적
재소한인민족운동사:한국사 연구총서 1
국학자료원
1998
[64]
간행물
名刑事 手帖에서, 梁槿煥 捷捕 秘話, 東京警視廳 大澤刑事 手記
삼천리사
1939-06
[65]
서적
식민지 조선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에디터
2003
[66]
서적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67]
서적
1920년대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2001
[68]
서적
역사에 비춘 한국 근현대인물
백산출판사
1995
[69]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70]
서적
윤치호 일기:1916-1943
역사비평사
2002
[71]
신문
祭祀料 御下賜, 李王殿下께서 故閔氏에
每日申報
1921-02-21
[72]
서적
한국사 이야기 20: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길사
2004
[73]
신문
故閔元植氏의 十週忌追悼 관민유력자 백여명기희집 紀念講演도 盛況
매일신보
1931-10-14
[74]
신문
參政先驅者追憶 故閔元植氏墓前 政治處遇報告祭
매일신보
1945-03-31
[75]
신문
參政先驅者追憶 故閔元植氏墓前 政治處遇報告祭
매일신보
1945-03-31
[76]
서적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 5:1920년대 일제 의 민족 분열 통치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09
[77]
서적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국학자료원
2011
[78]
서적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79]
서적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80]
서적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1999
[81]
신문
식구대로잡혀
대한매일신보
1908-01-31
[82]
신문
민씨문초
대한매일신보
1908-01-31
[83]
서적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비한국학연구총서 1
역사비평사
1997
[84]
신문
閔元植氏 丁憂
매일신보
1918-05-23
[85]
신문
식구대로 잡혀
대한매일신보
1908-01-31
[86]
뉴스
진명학원이사장 嚴柱明씨 별세
조선일보
1976-02-08
[87]
서적
통일운동시대의 역사인식
서해문집
2008
[88]
서적
분단의 내일 통일의 역사:당대총서 15
당대
2001
[89]
서적
우리 한국사
푸른역사
2006
[90]
서적
난세에 길을 찾다
시공사
2009
[91]
서적
난세에 길을 찾다
시공사
200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