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슈 왕조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규슈 왕조설은 일본 고대사에서, 기원전부터 7세기 말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정권이 규슈에 존재했다는 가설이다. 이 설은 에도 시대부터 제기된 일본 고대 기록 간의 모순에 대한 해석으로 시작되었으며, 후루타 다케히코의 저서 『잃어버린 규슈 왕조』가 출간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규슈 왕조설은 왜의 5왕이 규슈의 왕이었고, 다자이후가 수도였으며, 임신의 난과 같은 주요 사건들이 규슈를 무대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이 설은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지만, 통설과 다른 점, 사료 해석의 자의성, 고고학적 증거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규슈 왕조설은 규슈 왕조 일원론으로 흐를 수 있으며, 임나일본부설과 연결될 가능성 때문에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야마타이국 - 친위왜왕
친위왜왕은 238년 위나라가 야마타이국의 히미코에게 내린 칭호이며, 이는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야마타이국 - 왜국
왜국은 고대 중국 역사서에 나타난 일본 열도의 국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그 어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으며, 7세기 후반 일본이라는 국호로 변경되기 전까지 고대 한반도 국가들과 교류했다. - 일본의 역사 논란 - 하타 이쿠히코
하타 이쿠히코는 일본의 역사학자로, 일본 근현대사와 군사 및 전쟁사를 연구하며 난징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다수의 저서를 저술하여 일본 내외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여러 상을 수상했다. - 일본의 역사 논란 - 오케하자마 전투
오케하자마 전투는 1560년 오다 노부나가가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기습하여 승리한 전투로, 이마가와 가문을 몰락시키고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 확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왜인전 - 히미코
히미코는 3세기경 야마타이국을 다스린 여왕으로, 《삼국지》 위지 왜인전에 기록되어 있으며 주술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전해지지만 실존 여부와 야마타이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 왜인전 - 금관가야
금관가야는 1세기 중엽부터 4세기 말까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철 생산과 해상 무역을 통해 번성했으며, 김수로왕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42년에 건국되어 532년 신라에 투항하여 멸망했다.
2. 논쟁의 경위
에도 시대부터 고지키와 일본 서기에 기록된 내용과 중국 사서의 기록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석이 등장했다. 마쓰시타 겐린은 이칭 일본전에서 중국 사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마타이국과 왜의 5왕 모두 일본 서기의 기술에 일치하도록 해석했지만, 왜왕 무를 유랴쿠 천황과 세이네이 천황 두 명으로 비정하는 등 현대 문헌사학의 수준에서 보면 미숙한 점이 있었다. 마쓰시타의 야마타이국 기내설이나 왜의 5왕 긴키 천황가설은 현재처럼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세기에 왜노국이 북부 규슈를 중심으로 성립하여 한(漢)에 조공하고 "한위노국왕" 금인을 받았다.[5] 히미코는 이토국에 도읍을 정했고, 왜국은 후쿠오카 평야의 노국을 중심으로 했다.[6] 히미코는 쓰쿠시군의 조상인 미카요리히메이며, 이요는 한풍의 이름을 칭한 최초의 왜왕이다. 왜의 5왕도 규슈 왜국의 왕이었다.[7]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어계개언에서 야마타이국이나 왜의 5왕은 본래 왜왕인 긴키 천황가가 아니라 구마소나 임나일본부가 왜왕을 참칭했다는 구마소 위참설을 주장했다. 이 구마소 위참설을 완성한 것은 쓰루미네 모신이며, 그는 중근세 문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다이호 이전의 고대 연호에 대해서도 고대의 규슈 연호라고 주장하는 등 현재의 규슈 왕조설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이마이즈미 사다스케, 이다 타케고, 나가누마 겐카이, 이노우에 히데오 등이 구마소 위참설이나 규슈 왕조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야 연구자였지만 신란 연구 등으로 학계에서도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았던 후루타 다케히코의 저서 『잃어버린 규슈 왕조』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의 규슈 왕조설에 관한 논문 「다원적 고대의 성립」은 사학 잡지에도 게재되는 등 학계와 아마추어 양쪽에서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았다. 이노우에 미쓰사다, 야스모토 요시노리 등과 논쟁이 벌어졌고, 시민의 고대 연구회가 결성되면서 후루타의 학설은 "후루타 사학"이라고 불리며 주로 아마추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세를 풍미했다.
도리우가이산군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후루타의 학계 영향력이 저하되고, 시민의 고대 연구회가 분열되면서 규슈 왕조설은 예전만큼 널리 퍼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후루타의 학설을 계승하는 후루타 사학의 회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역사학자나 유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4]
3. 주요 주장
이와이는 규슈 왜국의 왕이었고, 게이타이는 규슈 남부의 호족이었다. 이와이의 난은 규슈 왜국에서 게이타이가 반란을 일으켜 부열조(武烈朝)를 무력으로 토벌한 사건이다.[7] 규슈 왜국에서 일본 최초의 독자적인 연호(규슈 연호)가 사용되었다. 수 왕조와 대등한 외교를 한 俀왕은 규슈 왜국의 왕이었다.[8] 다자이후는 규슈 왜국의 수도였으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의 사신응을 고려한 계획 도시였다.
백촌강 전투에서 규슈 왜국은 패배했다. 임신(닌신)의 난은 규슈를 무대로 했으며, 기나이(畿内)의 호족 오아마 황자(덴무 천황)가 개입하여 일본 열도의 패권을 얻은 사건이다.[9] 다이카 개신(을사의 변)은 후지와라노 가마타리(후지와라노 후히토와 동일 인물)가 규슈 왜국의 천황과 그의 아들을 암살하고 가루 황자(몬무 천황)를 즉위시킨 사건이다.
진무 천황 동정은 6세기에 임나 멸망 등으로 발생한 난민의 일부가 규슈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기나이에 나라를 세운 것이다. 『고사기』, 『일본서기』는 규슈 왜국의 역사서이다. 만엽집의 노래 등도 8세기까지의 오래된 것은 대부분 규슈에서 읊어졌다.
3. 1. 후루타 설
후루타 다케히코는 규슈 왕조설을 주장했으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고다 설 주요 다른 부분, 고다 논문 『사학 잡지』, 『사림』 게재 등 규슈 왕조설 논자 중 몇 안 되는 학설 형태로 세상에 질문.
고다 저서 『잃어버린 규슈 왕조』, 『고대는 빛나고 있었다』, 『고다 타케히코의 고대사 백문백답』에 따름.
고다 설 특징적 주장.
후루타케히코(古田武彦)를 비롯한 규슈 왕조설 논자 주류([http://www.furutasigaku.jp/jfuruta/jimmuj.html 후루타사학회 공식 HP])
어느 것 근거 될 수 없는 유치한 것.
규슈 왕조설 후루타케히코 결사 8대 진무 천황 이래 긴키 분왕조(규슈 왕조 분가) 실재 주장.
규슈 왕조설 근거 보듯 많은 증거 있음 불구 일본 고대사 학계 묵살. 다음 이유 때문.
# 통설 너무나 동떨어져 일본 고대사 학계 많은 연구 성과 부정[78]。
# 후루타 타케히코(古田武彦)와 그의 지지자들 사료 비판 등 역사학 기초 절차 존중 않음[79]。
# 후루타 타케히코 한문 해석 임의적[80]。
# 중요한 고문서 제대로 읽지 않음[81]。
3. 2. 규슈 왕조설론자 간의 논쟁점
규슈 왕조설론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점이 존재한다. 주요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 진무 천황의 동정 설화의 신빙성
후루타 다케히코는 진무 동정 전승을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규슈 왕조의 왕자였던 진무 천황이 야요이 시대 후기에 야마토 분지에 침입하여 규슈 왕조의 분왕조로서 긴키 천황가를 창시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일부 규슈 왕조설론자들은 진무 천황 비실재설이나 진무·스진 천황 동일 인물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후루타 사학회의 대표인 코가 타츠야는 진무 천황의 실재는 인정하지만, 그 설화에는 규슈 왕조의 천손강림 설화에서 도용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 긴키 천황가의 존재에 관하여
후루타의 규슈 왕조설은 다원 왕조설의 하나로 주장되었으며, 긴키 천황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무 천황, 결사팔대, 진구 황후의 실재를 인정하는 점에서는 전후의 츠다 사학보다 후루타 사학이 기기(記紀)의 전승을 존중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일부 규슈 왕조설론자들은 긴키 천황가의 전승 대부분을 규슈 왕조(또는 부젠의 분왕조)에서 도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오진 천황 이후의 역사만이 긴키 천황가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또한 게이코 천황, 오진 천황, 닌토쿠 천황, 게이타이 천황, 긴메이 천황 등 많은 천황이 실제로는 규슈 왕조의 천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긴키 천황가의 일부 천황이 실제로는 긴키가 아닌 규슈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설은 규슈 왕조설론자 외에도 미즈노 유나 사카타 타카시도 주장했지만, 후루타는 이러한 주장을 부정했다.
: 이키 이치로는 일본서기가 후지와라노 후히토에 의해 창작되었으며, 간사이에 존재한 것은 긴키 천황가가 아니라 부상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루타는 대안으로 "부상국 간토설"을 제시하며, 긴키 천황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구노국의 위치
후루타는 처음에는 구노국 사누키설을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구노국 긴키설로 전향했다. 이처럼 후루타 자신의 주장이 변천하면서 구노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규슈 왕조설론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 기존의 야마타이국 규슈설론자들처럼 구노국의 위치를 야마타이국(야마이치국)의 남쪽인 남규슈로 비정하는 논자도 있다.
; 전기 난파궁(前期難波宮)의 위치
전기 난파궁은 7세기의 다자이후와 함께 조방 도시이다. 후루타는 전기 난파궁이 고토쿠 천황의 나니와 나가라노 도요사키 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전기 난파궁이 무엇의 유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 코가 타츠야는 전기 난파궁이 전후 시대의 긴키 천황가의 궁궐과 연속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자이후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전기 난파궁의 조영·소실 연대와 규슈 연호의 개원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기 난파궁 규슈 왕조 부도설"을 제창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루타 사학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 쇼토쿠 태자에 관하여
후루타는 쇼토쿠 태자 가공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쇼토쿠 태자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견수사는 실제로는 규슈 왕조가 파견한 것이며(쇼토쿠 태자는 견당사를 파견했다), 법화의소는 쇼토쿠 태자의 진필이 아니라 규슈 왕조의 조궁 법황이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를 받아들여 쇼토쿠 태자 관련 업적 대부분을 규슈 왕조에서 도용했다고 주장하거나, 쇼토쿠 태자 가공설을 주장하는 논자도 있다.
4. 규슈 왕조설의 근거
고지키나 일본 서기 (8세기 성립)에는 야마타이국(야마이치국)이나 왜의 5왕에 대한 기술이 없지만, 오래된 중국의 사서와는 시기도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위지왜인전(3세기 성립)에서는 위(대방군)에 대한 조공은 히미코, 이요라는 두 여왕의 업적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서기에서는 위에게 조공한 왜왕은 진구 황후 한 명으로 되어 있다.[4]
이러한 모순은 에도 시대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마쓰시타 겐린은 이칭 일본전에서 중국 사서의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마타이국도 왜의 5왕도 모두 일본 서기의 기술에 일치하도록 해석했지만, 그 내용은 왜왕 무를 유랴쿠 천황과 세이네이 천황의 두 사람으로 비정하는 등 현대의 문헌사학의 수준에서 보면 미숙한 면이 존재한다. 마쓰시타 겐린의 야마타이국 기내설이나 왜의 5왕 긴키 천황가설은 현재처럼 널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많은 국학자에게 영향을 준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어계개언에서 야마타이국이나 왜의 5왕은 본래의 왜왕인 긴키 천황가가 아니라 구마소나 임나일본부가 왜왕을 참칭했다고 하는 구마소 위참설을 주장했다. 이 구마소 위참설을 완성한 것이 쓰루미네 모신이며, 그는 중근세 문서에 빈번히 등장하는 다이호 이전의 고대 연호에 대해서도 고대의 규슈 연호라고 주장하는 등 현재의 규슈 왕조설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이마이즈미 사다스케, 이다 타케고, 나가누마 겐카이, 이노우에 히데오 등이 구마소 위참설이나 규슈 왕조설을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후루타 다케히코의 저서 『잃어버린 규슈 왕조』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그의 규슈 왕조설에 의한 논문 「다원적 고대의 성립」은 사학 잡지에도 게재되는 등, 학계·아마추어의 쌍방에서 그의 설은 일정 부분 평가를 받았으며, 이노우에 미쓰사다나 야스모토 요시노리 등과의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시민의 고대 연구회가 결성되자 후루타의 학설은 "후루타 사학"이라고 불리며, 주로 아마추어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세를 풍미하게 되었다.
도리우가이산군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후루타의 학계에서의 영향력 저하, 시민의 고대 연구회의 분열, 더 나아가 학술 논문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논문의 난립도 있어 현시점에서는 규슈 왕조설은 한때만큼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후루타의 학설을 계승하는 후루타 사학의 회는 신춘 강연회에 정설파 학자도 초빙하고, 오사카 부립 대학의 강사가 간부를 맡는 등,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헤이세이 30년) 토코로 이사오가 저서 『연호 연호에서 읽어내는 일본사』에서 부정적으로, 소설가 백전상수가 저서 『일본 국기』에서 긍정적으로 다루는 등 지금도 역사가나 유명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학설이다.
규슈 왕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원전부터 7세기 말까지 일본을 대표한 정권은 일관되게 규슈에 있었으며, 왜(ゐ), 대왜(たゐ), 俀|타이중국어라고 불렸다.[5]
- 1세기에는 왜노국(왜국)이 북부 규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성립하여, 왜노국왕(왜왕)은 하카타만 근처에 수도를 두고 한에 조공하여 "한위노국왕"의 금인을 수여받았다.
- 왜왕 히미코(히미카)는 이토국에 도읍을 정했고, 왜국은 후쿠오카 평야의 노국(당시로서는 대도시인 2만 호)을 중심으로 했다.[6] 한이 멸망하고 위가 흥기하면서, "한위노국왕"의 금인 대신 위로부터 "친위왜왕"의 금인이 수여되었다.
- 히미코는 쓰쿠시군의 조상인 미카요리히메(甕依姫)이다. 또한, 이요(ゐよ)는 한풍의 이름(왜여)을 칭한 최초의 왜왕이다.
- 왜의 5왕(찬, 진, 제, 흥, 무)도 규슈 왜국의 왕이며, 각각 왜찬, 왜진, 왜제, 왜흥, 왜무로 칭했다.
- 쓰쿠시군 이와이(와이)는 왜(규슈)의 왕(부열천황)이며, 게이타이는 규슈 남부의 호족이다. 이와이의 난은 규슈 왜국에서 게이타이가 반란을 일으켜 부열조를 무력으로 토벌한 기사이다.[7]
- 규슈 왜국의 게이타이조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연호(규슈 연호)가 세워졌다.
- 수 왕조와 대등한 외교를 한 "俀중국어왕 성 아매 자 다리사북고 호 아배계|일본어미"[8]는 규슈 왜국의 왜왕이었다.
- 다자이후는 왜경 원년(618년)부터 규슈 왜국의 멸망까지 왜경이라고 불리는 규슈 왜국의 도읍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의 사신응을 고려한 계획 도시였다.
- "백촌강 전투"에서는 총사령관인 규슈 왜국의 천황 "쓰쿠시군 사치야마(사치야마・왜사)"가 당군의 포로가 됨으로써 규슈 왜국은 패배했다.
- "임신(닌신)의 난"은 기내(킨나이)가 아니라 규슈를 무대로 했으며, 난 전해에 당군의 포로에서 풀려나 왜(규슈)로 귀국한 사치야마(실은 천황의 다카이치 황자)와 사치야마가 부재 중일 때 정무를 대행하던 중궁 천황(토치노 황녀)-오토모 황자(고분천황)의 대립에 기내의 호족 오아마 황자(덴무천황)가 개입하여 일본 열도의 패권을 얻은 사건이며, 승패를 결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노로부터의 원군은 기내 일본군이다.
- "임신의 난"에서 규슈 왜국의 천황(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은 오아마 황자(덴무)의 힘을 빌려 오토모 황자에게 승리했지만, 협력을 얻기 위해 요시노의 맹약에서 오아마 황자(덴무)와 규슈 왜국 계열의 우노노사라라 황녀(지토천황) 사이의 아들(구사카베 황자)를 후계자의 황태자로 삼았다. 전란으로 규슈의 유력 호족 대부분이 멸망하여 천황(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전란과 그에 따른 천재지변[9]으로 황폐화된 규슈에서 덴무의 세력권인 기내로 천황(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은 옮겨갔다.
- "다이카 개신"(을사의 변)은 황태자였던 구사카베 황자가 즉위하지 못하고 서거했기 때문에 다음 황위에 누가 오를지 불분명해지고, 의심에 휩싸인 구사카베 황자의 아들인 가루 황자(몬무천황)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후지와라노 후히토와 동일 인물)가 규슈 연호의 다이카(다이카) 원년(695년)에 후지와라쿄에서 천황(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과 그의 아들을 암살하고, 다음 해 다이카 2년(696년)에 가루 황자(몬무천황)가 즉위한 사건이다.
- 진무천황 동정은 6세기에 임나 멸망 등으로 발생한 난민의 일부가 규슈에서 동정한 것으로, 먼저 규슈에서 기내에 식민하여 거대한 고분을 축조했던 니기하야히노미코토가 지배하는 나가스네히코 등의 나라인 히가시(일본)를 정복한 것이다. 아스카 시대까지는, 야마토 왕권(일본・히가시)은 아직 일본을 대표하는 정권이 아니었고 기내의 지방정권에 불과했지만, 몬무의 시대에 규슈 왜국으로부터 정권을 완전히 빼앗아 일본 전체가 "일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 고지키・일본서기는 규슈 왜국의 역사서이며, 쇼쿠니혼기는 덴무조의 역사서이다. 기기에 기록된 천황 중 초대 진무천황과 제9대까지의 결사팔대의 천황 및 제40대 덴무천황과 제41대 지토천황, 쇼쿠니혼기에 기록된 제42대 몬무천황부터 제48대 고켄천황까지 7대, 총 18대만이 덴무조에 이어진 계보이다. 기기에 기록된 덴무계의 천황은 천황이 아니라 기내의 지방 호족에 불과했다. 기기에 기록된 그 밖의 천황은 규슈 왜국의 천황이다.
- 만엽집의 노래 등도 8세기까지의 오래된 것은 대부분 규슈에서 읊어진 것이다.
- 진키 6년(729년) 후지와라 씨는 규슈 왜국 계열인 나가야 왕자를 나가야 왕의 변에서 말살했다.
- 제3회 신궁식년천궁(진키 6년/덴표 원년(729년) - 덴표 4년(732년))에 의해 이세 신궁이 야쓰시로시에서 이세시로 옮겨졌다.
- 진고케이운 4년(770년) 쇼토쿠천황 암살로 덴무조가 단절되고, 후지와라 씨는 멸망한 규슈 왜국의 말예(고닌천황)를 천황으로 옹립했다.
규슈 왕조설은 1차 사료가 부족하여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 『일본서기』의 신대(神代) 편에 "쓰쿠시(筑紫)"는 14번 출현하지만 "야마토(大和)"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는다.
- 규슈 왕조설은 규슈 왕조 일원론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기기의 기초가 된 규슈 왕조의 사서가 규슈 왕조 일원론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이다. 후루타 다케히코는 자신의 가설은 규슈 왕조와 야마토 왕조의 쌍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원 왕조설]"이며 규슈 왕조 일원설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언하고 있다.
- 규슈 왕조설 지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백촌강 전투, 임신의 난, 다이카 개신 중 어느 시점까지를 규슈 왜국의 역사로 보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
규슈 왕조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부 주장들을 포함한다.
1. 왜의 5왕은 규슈의 대왕고사기에 따르면, 쓰쿠시 섬(규슈)은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넷이라고 하며, 이는 쓰쿠시국, 도요국, 히국, 구마소국을 가리킨다.[27] "왜의 5왕"의 재위년과 『일본서기』에서의 각 천황의 재위년이 전혀 맞지 않는다. 또한 야마토 왕권의 대왕이 "왜의 5왕"과 같은 찬(讃), 진(珍), 제(濟), 흥(興), 무(武) 등 한 글자 한자 이름의 한풍의 이름을 칭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조(동진-양) 측에서 멋대로 동이의 왕에게 한풍의 이름을 붙이는 일도 없어 "왜의 5왕"은 야마토 왕권의 대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긴키 지방에는 많은 거대한 고분이 조영되었지만, 동일 왕권이 대규모 대외 전쟁을 지속하면서[27] 동시에 이와 같은 대규모 거대 고분의 조영을 다수 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28] 따라서 긴키 지방에 많은 거대 고분을 만들었던 것은 한반도에서 활발하게 군사 활동을 행하고 있던 "왜"와는 어느 정도 독립된 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고분 문화의 확산을 야마토 왕권 세력의 확대라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종교 문화의 확산과 권력의 확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고분은 호족의 묘이며, 이것이 각지에서 만들어진 것은 중앙과는 독립된 지방 세력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야마토 왕권 세력의 지배력이 확대되었다는 설과도 모순된다. 이 시대는 고분의 형태도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어, 이즈모나 기비 등에도 독립된 세력이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송서』 478년의 왜왕 무의 상표문에서 "동정모인 55국, 서복중이 66국, 도평해북 95국"이라고 하는데, 왜왕 무는 스스로를 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통설처럼 왜를 기내로 하면 "동의 모인" = 주부・간토, "서의 중이" = 기내, 주고쿠・시코쿠, 규슈, "건너 해북" = ???가 되며, 비정지를 자연스럽게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왜를 규슈로 하면, "동의 모인" = 기내, "서의 중이" = 규슈, "건너 해북" = 한반도 남부라는 형태로, 비정지를 자연스럽게 특정할 수 있다.[29][30]
2. 규슈 왜국의 대륙과의 교류광개토왕비,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에 따르면, 왜는 백제와 동맹을 맺은 366년부터 백강 전투(663년)까지 약 300년간 거의 4년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한반도에 출병했다.[31] 당시 통신 수단이 미발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사령부는 최전선과 가까운 북부 규슈에 위치해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는 오랜 교류를 통해 수·당의 사회 제도, 문화, 외교 의례에 익숙했을 것이나, 초기 견수사 파견에서 기내 일본은 외교 의례에 미숙했고 국서도 없이 견수사를 파견했다고 한다.[32] 또한 견수사·견당사와 유학생들을 통해 기내 지방에 당의 사회 제도와 문화가 처음으로 직접 전해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기내 지방에 수·당의 사회 제도와 문화가 거의 전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규슈 왜와 기내 일본이 명확히 구분됨을 시사한다.
5세기의 왜의 5왕은 중국 남조에 12번이나 조공하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였으며, 백강 전투에서는 약 1천 척의 군선과 수만 명의 군세를 파견하여 당의 수군과 대규모 해전을 벌이는 등 높은 수준의 항해술과 도해 능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마토 왕권이 파견한 견당사선의 항해 성공률은 50%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왕조 교체로 인해 항해 기술이 단절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서기』 등 야마토 왕권의 사서에는 다자이후의 설치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도성 자체의 건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방위 시설 유적은 북규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방어해야 할 중심지가 기나이, 특히 야마토가 아니라 다자이후였음을 시사한다. 미즈키와 소재가 명확한 고대 산성은 대부분 북규슈에 위치하며, 야마토 왕권의 축성 기록이 없는 "고노고이시(신령석)식 산성" 역시 북규슈에서 세토 내해 연안에 걸쳐 존재하지만 대부분 북규슈에 집중되어 있다.
위지왜인전에 따르면, 규슈에는 여왕국과 함께 이토국이 존재했으며, 여왕국과 대륙 간 무역 중계지로서 일대솔이 설치되어 "위·대방군·한 제국으로의 사자, 및 대방군에서 왜국으로의 사자를 조사하고, 그 문서·사물을 오류 없이 여왕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토국 지역에서는 대륙과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되었고, 대방군 이전인 기원전 1세기의 왕묘도 발견되었다.
일대솔은 현재의 후쿠오카현 서부(이토시마)에 상주하며 "여왕국 이북의 주변 제국을 검찰하여 제국에 두려움을 주었다"고 한다.[59] 여왕국이 상당한 범위를 통치했음에도 멸망한 것은 교역 상대였던 대방군이 5세기경 백제에 의해 멸망하여 전마 등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야마토국에 제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7세기 이전에 무문은전이나 부본전 등의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된 곳은 규슈이며, 8세기 이후 야마토 왕권은 규슈의 부본전 등을 참고하여 와도카이친 등의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 서일본을 중심으로 야요이 시대의 유적에서 진나라, 전한의 통화인 반량전, 전한에서 수나라의 통화인 오수전, 신나라의 통화인 화천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 《위지왜인전》에는 "배를 타고 남북으로 나가 쌀을 사고 판다", "나라마다 시장이 있고, 거래의 유무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감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왜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 《속일본기》 769년의 기사에서 다자이후의 관리가 조정에 "이 부는 사람의 왕래와 거래가 성행하여 일본 제일의 도시다"라고 보고한 것처럼, 북부 규슈에서는 8세기에 이미 경제 활동이 활발했다.
- 야마토 왕권이 발행한 최초의 화폐는 와도카이친(게이운 5년/와도 원년(708년))이다. 그러나 고대 일본에는 와도카이친 이전에도 무문은전이나 부본전(덴무 천황 12년(683년)) 등의 화폐가 존재했다.
- 와도카이친 등의 동전조차 스오국(야마구치현야마구치시 주전사·시모노세키시 조후 안요지 마을) 등의 서일본에서 대부분 주조되었다.
- 와도카이친의 사주전이 만연한 716년에는 조정은 다자이후에 대해 재료 거래 단속을 명령했다.[60]
- 규슈에는 고대로부터 하카타항, 보쓰, 야쓰시로항 등이 있었지만, 기나이 지방에는 외양 항해가 가능한 대형 상선이 정박할 수 있는 무역항은 다이라노 키요모리가 12세기에 오와다노토마리(고베항)를 정비할 때까지 없었다.
- 축전서위령(와도 4년(711년) - 엔랴쿠 19년(800년)) 등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나이 지방에서는 8세기가 되어도 통화 경제는 미발달했다. 기나이 지방에서 통화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12세기에 다이라노 키요모리에 의해 다량의 송전이 수입되고 나서이다.
3. 이와이의 난磐井の乱|이와이노 란일본어은 게이타이 천황이 무레쓰 천황을 무력으로 토벌하고 정권을 탈취한 규슈 내 왕조 교체의 사건이라는 주장이 있다.[7]
4. 쇼토쿠 태자와 규슈 연호우마야도노 왕자와 "해 뜨는 곳의 천자"는 다른 인물이며, "해 뜨는 곳의 천자"는 규슈 왜국의 인물이었다고 한다.[38] 쇼토쿠 태자는 관위 십이 계를 제정하고, 견수사를 파견했으며, 불교에 깊이 귀의했다. 우마야도노 왕자는 기나이(畿内) 일본의 인물이며, 이렇다 할 실적은 없다고 생각된다.
-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俀중국어국」에 따르면, 俀중국어국왕 다리사북고(해 뜨는 곳의 천자)의 나라는 산섬에 있으며, 俀중국어국에는 아소산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俀중국어국은 규슈를 가리킨다.[39]
- 개황 20년(600년)의 "왜왕 성 아매 자 다리사북고"・"왜왕, 성은 아매, 자는 다리사북고."는 남왕이며 "왕의 아내는 雞일본어彌(키미)로 칭한다. 후궁에 여자가 600 - 700명 있다. 태자의 이름을 리가미다후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쇼토쿠 태자가 스이코 천황을 대신한 것을 고려해야 하며 俀중국어국왕 자신은 '''태자'''도 '''여제'''(스이코 천황)도 아니다. 또한, 당시 俀중국어국 왕이 여성이라면, 유교의 영향이 강한 수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므로, 수나라 사신은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기록에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40]
- 『고지키』 "요메이 천황기"에는 "우마야도노 도요사토미미노 미코토"라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업적에 관한 내용은 없다.
- 『호류지 금당 석가 삼존상』은 "우마야도 왕자"의 상이 아니다.
- 『일본서기』에서 우마야도 황자는 스이코 천황 29년(621년) 2월 계사(5일)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호류지 금당 석가 삼존상 광배명』의 조궁 법황 등하(とうか)는 "계미년(622년) 2월 22일"이다.
- 『일본서기』에서 우마야도의 어머니는 "하시다노 황녀", 부인은 "우지노 가이다코 황녀"이지만, 『석가 삼존상 광배명』의 조궁 법황의 어머니는 "오니노마에 태후", 부인은 "간시키노 왕후"로 되어 있다.
5. 평(評)을 제정한 것은 규슈 왜국「평(評)」을 제정했던 것은 야마토 왕권에 앞선 규슈 왜국이라는 주장이 있다.[41] 일본서기에서는 다이카 개신 때 '군(郡)'이 성립되었다고 기록하지만, 출토된 문서(목간류)에 의해 '군'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다이호 율령이 제정된 몬무 천황 5년(701년)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평'을 사용했던 것이 확인되었다.[41]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규슈 연호에서는 다이카 원년이 695년이며, 다이카 개신의 정변으로 규슈 왜국을 대신하여 기나이(畿內) 일본이 정권을 잡고 '평'을 대신하여 '군(郡)'이 사용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 사이메이 7년(661년) 6월과 덴지 7년(688년)에 두 번이나 서거 기사가 있는 이세 왕에 관한 기사는 34년 전의 일이며, 640년대에 규슈 왜국은 평 제도를 수립 개혁했을 가능성이 있다.[42]
- 『이요미시마 연기』에는 "고토쿠 천왕위, 반쇼(番匠) 첫 시작. 조쇼쿠 2무신(戊申), 일본국 어순례 주심."(고토쿠 천황 때, 반쇼(대규모 토목 공사)가 시작되고, 규슈 연호의 조쇼쿠(常色) 2년 무신(648년)에는 일본국에 어순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고토쿠 천황 때 전기 나니와노미야 조영이 시작되고, 다이카 4년(648년)에 천황이 규슈 왜국에서 기나이 일본국으로 행행하고, 그 도중에 이요에 들렀다는 것이다.
6. 규슈 왜국에서 야마토 왕권으로의 이동규슈에서 왕권이 이동하여 야마토 왕권이 확립된 것은 7세기 말이라는 주장이 있다.
- 고대 국가 성립 요건으로는 상설 정부(관료 기구), 상설 군대, 수도(도성)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토 천황 8년(694년) 이후에야 기나이 지방에서 갖춰졌으며, 그에 반해 규슈에는 노국이나 다자이후 등의 도성이 고대부터 존재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위지왜인전』의 야마이국이 북부 규슈에 있었다는 설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 후 규슈 왜국에서 기나이 일본으로 권력 이동이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역대 정사에서는 왜에 대한 기술이 일관되어 동일한 국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나라 정사 『구당서』, 『신당서』에서 7세기 말에 국호가 "왜"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시기에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추정하는 데 큰 개연성이 발견된다.[43]
- 만엽집에서는 8세기까지 다자이후(왜)를 일본과는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술의 혼란에 대해 모순 없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팔방을 다스리는 우리 대왕의 다스리는 나라는 일본도 이곳(다자이후·왜)도 같다고 생각한다(오토모노 다비토 만 6-956).
- 한 문명권에서는 새로 성립한 왕조가 자국의 권력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 왕조의 역사서인 "정사"를 편찬하는데, 『일본서기』, 『고사기』는 8세기 초두경에 편찬되었으므로, 야마토 왕권이 확립된 것은 7세기 말이라고 추정된다.
- 일본 각지의 사찰 연기나 지방의 지지·역사서 등에 야마토 왕권 이전에 규슈 왜국이 정했다고 할 수 있는 "규슈 연호"(게이타이 원년(517년) - 다이초 9년(712년))가 다수 발견된다. "규슈 연호" 또한 8세기 초두에 끝나므로, 이 시기에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추정함으로써 모순이 적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일본서기에 따르면 비다쓰 천황 13년(584년)에 기나이에 불교를 전한 것은 하리마에 있던 고구려의 환속 승려 에벤이다. 584년 이전에 이미 하리마에는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이며, 6세기 말 하리마는 기나이에게는 다른 문화권(= 외국)이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44]
7. 임신의 난672년 임신의 난의 전투 지역은 규슈 내였다는 주장이 있다.[45] 임신의 난으로 왕조 교체(역성혁명)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50]
- 이 시기에 헤이조쿄의 호류지도 소실되었고, 후에 북위의 양식으로 재건되었으므로, 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 이 난에서는 오이타노 에사카, 오이타노 와카오미 등의 규슈 호족들이 활약했다. 또한, 오아마 황자는 규슈 호족인 무나카타 씨의 딸(무나카타 아마코노 무스메)을 비로 삼았다.
- 오쓰쿄는 오미 오쓰(오쓰시)가 아니라, 히고 오쓰(오쓰마치)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오미 오쓰 부근에는 궁을 설치할 만한 넓은 토지가 없지만, 히고 오쓰 부근은 조방제의 흔적으로 보이는 동서와 남북으로 직교하는 길이 남아 있는 넓은 평야가 존재한다.
- 시가현 세타강에 걸린 세타의 당교는 장대하여, 일본서기의 기술처럼 임신의 난에서 갑옷을 겹쳐 입고 칼을 뽑아 돌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오쓰마치 세타 부근의 시라카와에 걸려 있었다면 다리는 짧아지고 기술대로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 오미 오쓰에서는 오쓰쿄로의 천도 이유 설명이 곤란하다. 히고 오쓰라면 "백촌강 전투
4. 1. 규슈(쓰쿠시 섬)
592년에 아스카쿄가 설치되기 전, 규슈(쓰쿠시 섬)에서는 쓰쿠시 국(다자이후)·도요 국·휴가 국·히 국 4개국이 히타 가도(거의 오늘날의 아사쿠라 가도)·휴가 가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외 남부의 구마소 국에는 하야토가 살고 있었다.전술한 4개국에는 국가 제도로서 부민제가 있어, 부족의 세습적인 직업을 정했다. 히 국에는 구사카베·미부베·다케베·구메베, 쓰쿠시 국·도요 국에는 모노노베나 오오가베, 신직인 호리베, 해사·어업부인 아마베 등이 있었다(오이타현의 아마베군은 각 지역과 달리 "아마베"라고 읽는다). 당시 왕조는 여러 지역의 백성이나 도래인을 조직하여 개간을 촉진하고, 둔전에 다베·누카타베 등도 만들었지만, 특히 규슈 내의 도요 국에는 20개 남짓의 둔전이 있었다. 527년의 이와이의 난 후에는 군사적 부민도 강화되었다.[14]
701년의 다이호 율령 이후, 규슈는 9개국(부젠、분고、지쿠젠、지쿠고、히젠、히고、휴가、오스미、사쓰마)이 되어 사이카이도라고도 불리며, 전체가 다자이후의 관할이 되었다. "규슈"라는 용어는 원래 고대에는 천자의 직할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주 시대 이전, 전토를 9개의 주로 나누어 다스리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9개의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참고: 규슈 (중국)).[15]
4. 2. 금인
하카타만(博多湾)의 시카노시마에서 발견된 「한위노국왕」 금인은 "한(漢)"의 "왜노국(倭奴国)"의 "왕(王)"으로 읽으며, 한(漢)의 신하인 왜왕(倭王, 왜노국왕)의 인수이며, 금인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금인의 소유자인 "왜왕"의 거성 "왜노국"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4]- 황제가 책봉국의 왕에게 하사한 금인에 "한의 ○의 ○의 국왕"과 같이 삼중으로 수식한 예가 없다는 점[16] (금인은 배신에게 주는 것이 아님)과, 높은 지위의 인이라는 점에서 이 금인은 "위노국왕" = "왜왕"에게 하사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漢)의 인 제도 및 금인의 역할로 볼 때, 통설과 같이 금인을 하카타만 정도의 영역 밖에 가지지 않은 소국이 받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히미코가 받았다고 하는 금인도 "친위왜왕"이며 왜왕에게 하사된 것이다. "한위노국왕" 인(印)도 "친위왜왕" 인(印)도 왜국의 국새로 취급되었고, 한(漢)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한위노국왕" 인(印)이, 위(魏)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친위왜왕" 인(印)이 계속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위노국왕의 금인을 시카노시마에 묻은 것은 히미코로 생각된다.
- 『구당서』 왜국 조의 서두 등, 그 이후의 몇몇 서적에 "왜국자는 고(古) 왜노국야(今の倭国は昔の(漢書の)倭奴国のことだ, 지금의 왜국은 옛날 (한서의) 왜노국의 것이다)" 등과 같은 기사가 있다.[17] 왜노국이란 왜(倭) 안의 소국 "노국"이 아니라 왜국 그 자체로 생각되며,[18] 왜국을 대표한다고 한(漢)이 인정한 나라이며, 한(漢)에 의해 왕[19]으로 인정받은 자가 사는 나라이다.[20]
- "왜(倭)"의 글자가 줄여져 "위(委)"의 글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왜(倭)"는 "위(委)"와 같은 발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1] 금인은 "칸 위도 코쿠 오(かん ゐど こく おう)" 또는 "칸 위나 코쿠 오(かん ゐな こく おう)"로 읽어야 한다.
- 현재에도 한국과 조선에서는 일본을 "왜노((왜노)웨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22][23]
4. 3. 야마타이국의 산물·교통
위지 왜인전에 따르면 야마타이국은 녹나무(櫲樟, 柟)나 단사(丹)와 같은 목재 및 광물의 산지였으며 대방군과 무역을 했다.[24] 불상이나 조선에 사용되는 녹나무는 주로 규슈에 분포하고, 오이타현의 구스군(쿠스는 구수, 구주로도 표기한다)의 지명은 녹나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단사는 불상의 도금이나 배 밑바닥의 방부제로 사용된 광물로 수은의 재료인데, 토요히노・토요노쿠니 터의 오이타시에는 단생신사가 있어 단사의 산지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항만 무역의 땅으로 기후네 신사도 많다.
일본서기의 진무 동정 일화에 따르면, 진무 천황은 휴가국에서 출발하여 토요노쿠니의 우사에서 우사츠히코가 건립한 하나기둥 등궁(あしひとつ あがりのみや)에 머문 후, 긴키로 건너가 진사의 광맥 조사를 했다.[24]
야요이 시대 중기~후기에는 규슈 북부 또는 이토국에 청동기 제조소가 있었다.[25]
왕조의 수도로 상정되는 다자이후에는 히타 가도가 통하고 있으며, 이 히타 가도는 히타에서 구루메, 나카츠, 구마모토, 벳푸로 각각 가도가 뻗어 있으며, 벳푸에서는 쓰쿠시국 터의 후쿠오카현 동해안에서 휴가국 터의 미야자키현을 잇는 휴가 가도에 접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토국의 일대솔과 마찬가지로, 위정자 측은 육로에서도 상당한 넓은 범위를 이동할 수 있었다.
위지 왜인전에 따르면, 큐슈에는 여왕국과 함께 이토국이 있었고, 여왕국과 대륙과의 무역 중계점으로서 일대솔이 설치되어 "교토(위)·대방군·한 제국으로의 사자, 및 대방군에서 왜국으로의 사자를 조사하고, 그 문서·사물을 오류 없이 여왕에게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했다"고 한다. 이토국 지역에서는 대륙과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출토품이 발견되었으며, 대방군 이전의 기원전 1세기의 왕묘도 발견되고 있다.
일대솔은 현재의 후쿠오카현 서부(이토시마)에 상주하고 있었고, "여왕국 이북의 주변 제국의 검찰을 행하여 제국에 두려움을 주었다"[59]고 한다.
7세기 이전에 무문은전이나 부본전 등의 화폐가 발행되었고 이러한 화폐가 유통된 곳은 규슈이며, 8세기 이후 야마토 왕권은 규슈의 부본전 등을 참고하여 와도카이친 등의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 서일본을 중심으로 야요이 시대의 유적에서 진나라, 전한의 통화인 반량전, 전한에서 수나라의 통화인 오수전, 신나라의 통화인 화천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 《위지왜인전》에는 "배를 타고 남북으로 나가 쌀을 사고 판다"・"나라마다 시장이 있고, 거래의 유무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감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왜는 교역이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속일본기》 769년의 기사에서 다자이후의 관리가 조정에 "이 부는 사람의 왕래와 거래가 성행하여 일본 제일의 도시다"라고 보고한 것처럼, 북부 규슈에서는 8세기에 이미 경제 활동이 활발했다.
- 와도카이친의 사주전이 만연한 716년에는 조정은 다자이후에 대해 재료 거래 단속을 명령했다.[60]
- 규슈에는 고대로부터 하카타항・보쓰・야쓰시로항 등이 있었다.
4. 4. 왜의 5왕은 규슈의 대왕
고사기에 따르면, 쓰쿠시 섬(규슈)은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넷이라고 하며, 이는 쓰쿠시국, 도요국, 히국, 구마소국을 가리킨다.[27] "왜의 5왕"의 재위년과 『일본서기』에서의 각 천황의 재위년이 전혀 맞지 않는다. 또한 야마토 왕권의 대왕이 "왜의 5왕"과 같은 찬(讃), 진(珍), 제(濟), 흥(興), 무(武) 등 한 글자 한자 이름의 한풍의 이름을 칭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조(동진-양) 측에서 멋대로 동이의 왕에게 한풍의 이름을 붙이는 일도 없어 "왜의 5왕"은 야마토 왕권의 대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긴키 지방에는 많은 거대한 고분이 조영되었지만, 동일 왕권이 대규모 대외 전쟁을 지속하면서[27] 동시에 이와 같은 대규모 거대 고분의 조영을 다수 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28] 따라서 긴키 지방에 많은 거대 고분을 만들었던 것은 한반도에서 활발하게 군사 활동을 행하고 있던 "왜"와는 어느 정도 독립된 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고분 문화의 확산을 야마토 왕권 세력의 확대라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종교 문화의 확산과 권력의 확산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고분 문화의 확산은 종교 의례의 확산이기도 하며, 야마토 왕권과의 결합에 대한 근거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고분 문화의 확산을 야마토 왕권 세력의 확대라고 하기에는 증거로서 무리가 있다. 고분은 호족의 묘이며, 이것이 각지에서 만들어진 것은 중앙과는 독립된 지방 세력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야마토 왕권 세력의 지배력이 확대되었다는 설과도 모순된다. 이 시대는 고분의 형태도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어, 이즈모나 기비 등에도 독립된 세력이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송서』 478년의 왜왕 무의 상표문에서 "동정모인 55국, 서복중이 66국, 도평해북 95국"이라고 하는데, 왜왕 무는 스스로를 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통설처럼 왜를 기내로 하면 "동의 모인" = 주부・간토, "서의 중이" = 기내, 주고쿠・시코쿠, 규슈, "건너 해북" = ???가 되며, 비정지를 자연스럽게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왜를 규슈로 하면, "동의 모인" = 기내, "서의 중이" = 규슈, "건너 해북" = 한반도 남부라는 형태로, 비정지를 자연스럽게 특정할 수 있다.[29][30]
4. 5. 규슈 왜국의 대륙과의 교류
광개토왕비,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에 따르면, 왜는 백제와 동맹을 맺은 366년부터 백강 전투(663년)까지 약 300년간 거의 4년에 한 번꼴로 빈번하게 한반도에 출병했다.[31] 당시 통신 수단이 미발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의 전투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사령부는 최전선과 가까운 북부 규슈에 위치해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 제사, 군사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왕은 북부 규슈의 사령부에 상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야마토 왕권과는 다른 왜왕이 북부 규슈에 상주하며 그곳에 왜의 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왜는 오랜 교류를 통해 수·당의 사회 제도, 문화, 외교 의례에 익숙했을 것이나, 초기 견수사 파견에서 기내 일본은 외교 의례에 미숙했고 국서도 없이 견수사를 파견했다고 한다.[32] 또한 견수사·견당사와 유학생들을 통해 기내 지방에 당의 사회 제도와 문화가 처음으로 직접 전해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기내 지방에 수·당의 사회 제도와 문화가 거의 전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규슈 왜와 기내 일본이 명확히 구분됨을 시사한다. 『구당서』 일본전에는 "개황 연간(581년 ~ 600년) 말에 처음으로 일본국이 수와 국교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견수사·견당사가 기내 일본과 수·당의 첫 직접 교류임을 알 수 있다.[33]
5세기의 왜의 5왕은 중국 남조에 12번이나 조공하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였으며, 백강 전투에서는 약 1천 척의 군선과 수만 명의 군세를 파견하여 당의 수군과 대규모 해전을 벌이는 등 높은 수준의 항해술과 도해 능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마토 왕권이 파견한 견당사선의 항해 성공률은 50%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는 왕조 교체로 인해 항해 기술이 단절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왜의 5왕의 항해 성공률이 5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일본서기』 등 야마토 왕권의 사서에는 다자이후의 설치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도성 자체의 건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방위 시설 유적은 북규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방어해야 할 중심지가 기나이, 특히 야마토가 아니라 다자이후였음을 시사한다. 미즈키와 소재가 명확한 고대 산성은 대부분 북규슈에 위치하며, 야마토 왕권의 축성 기록이 없는 "고노고이시(신령석)식 산성" 역시 북규슈에서 세토 내해 연안에 걸쳐 존재하지만 대부분 북규슈에 집중되어 있다.
위지왜인전에 따르면, 규슈에는 여왕국과 함께 이토국이 존재했으며, 여왕국과 대륙 간 무역 중계지로서 일대솔이 설치되어 "위·대방군·한 제국으로의 사자, 및 대방군에서 왜국으로의 사자를 조사하고, 그 문서·사물을 오류 없이 여왕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토국 지역에서는 대륙과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되었고, 대방군 이전인 기원전 1세기의 왕묘도 발견되었다.
일대솔은 현재의 후쿠오카현 서부(이토시마)에 상주하며 "여왕국 이북의 주변 제국을 검찰하여 제국에 두려움을 주었다"고 한다.[59] 여왕국이 상당한 범위를 통치했음에도 멸망한 것은 교역 상대였던 대방군이 5세기경 백제에 의해 멸망하여 전마 등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야마토국에 제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야마토 조정이 봉국을 부젠국과 분고국으로 분할한 이유도 양질의 말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거리 이동이 곤란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일대솔의 "솔"이 대륙의 용어라는 점과 후대 분고국의 초대 국사 요코 마미가 한어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율령제 이전에는 봉국 (오이타현)에 이르는 지역의 언어에도 위(대방군)의 영향이 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세기 이전에 무문은전이나 부본전 등의 화폐가 발행되어 유통된 곳은 규슈이며, 8세기 이후 야마토 왕권은 규슈의 부본전 등을 참고하여 와도카이친 등의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 서일본을 중심으로 야요이 시대의 유적에서 진나라, 전한의 통화인 반량전, 전한에서 수나라의 통화인 오수전, 신나라의 통화인 화천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
- 《위지왜인전》에는 "배를 타고 남북으로 나가 쌀을 사고 판다", "나라마다 시장이 있고, 거래의 유무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감시한다"라고 기록되어 왜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 《속일본기》 769년의 기사에서 다자이후의 관리가 조정에 "이 부는 사람의 왕래와 거래가 성행하여 일본 제일의 도시다"라고 보고한 것처럼, 북부 규슈에서는 8세기에 이미 경제 활동이 활발했다.
- 《속일본기》 등의 기사와 그 전문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야마토 왕권이 발행한 최초의 화폐는 와도카이친(게이운 5년/와도 원년(708년))이다. 그러나 고대 일본에는 와도카이친 이전에도 무문은전이나 부본전(덴무 천황 12년(683년)) 등의 화폐가 존재했다.
- 와도카이친 등의 동전조차 스오국(야마구치현야마구치시 주전사·시모노세키시 조후 안요지 마을) 등의 서일본에서 대부분 주조되었다.
- 와도카이친의 사주전이 만연한 716년에는 조정은 다자이후에 대해 재료 거래 단속을 명령했다.[60]
- 규슈에는 고대로부터 하카타항, 보쓰, 야쓰시로항 등이 있었지만, 기나이 지방에는 외양 항해가 가능한 대형 상선이 정박할 수 있는 무역항은 다이라노 키요모리가 12세기에 오와다노토마리(고베항)를 정비할 때까지 없었다.
- 축전서위령(와도 4년(711년) - 엔랴쿠 19년(800년)) 등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나이 지방에서는 8세기가 되어도 통화 경제는 미발달했다. 기나이 지방에서 통화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12세기에 다이라노 키요모리에 의해 다량의 송전이 수입되고 나서이다.
4. 6. 이와이의 난
磐井の乱|이와이노 란일본어은 게이타이 천황이 무레쓰 천황을 무력으로 토벌하고 정권을 탈취한 규슈 내 왕조 교체의 사건이라는 주장이 있다.[7]4. 7. 쇼토쿠 태자와 규슈 연호
우마야도노 왕자와 "해 뜨는 곳의 천자"는 다른 인물이며, "해 뜨는 곳의 천자"는 규슈 왜국의 인물이었다고 한다.[38] 쇼토쿠 태자는 관위 십이 계를 제정하고, 견수사를 파견했으며, 불교에 깊이 귀의했다. 우마야도노 왕자는 기나이(畿内) 일본의 인물이며, 이렇다 할 실적은 없다고 생각된다.- 『수서』 「권81 열전46 동이 俀중국어국」에 따르면, 俀중국어국왕 다리사북고(해 뜨는 곳의 천자)의 나라는 산섬에 있으며, 俀중국어국에는 아소산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므로, 俀중국어국은 규슈를 가리킨다.[39]
- 개황 20년(600년)의 "왜왕 성 아매 자 다리사북고"・"왜왕, 성은 아매, 자는 다리사북고."는 남왕이며 "왕의 아내는 雞일본어彌(키미)로 칭한다. 후궁에 여자가 600 - 700명 있다. 태자의 이름을 리가미다후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쇼토쿠 태자가 스이코 천황을 대신한 것을 고려해야 하며 俀중국어국왕 자신은 '''태자'''도 '''여제'''(스이코 천황)도 아니다. 또한, 당시 俀중국어국 왕이 여성이라면, 유교의 영향이 강한 수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므로, 수나라 사신은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기록에 남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40]
- 『고지키』 "요메이 천황기"에는 "우마야도노 도요사토미미노 미코토"라는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업적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만, 기술이 없다는 것은 쓸 필요가 없는 작은 업적이 다수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며, 업적 자체가 없다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
- 『호류지 금당 석가 삼존상』은 "우마야도 왕자"의 상이 아니다.
- 『일본서기』에서 우마야도 황자는 스이코 천황 29년(621년) 2월 계사(5일)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호류지 금당 석가 삼존상 광배명』의 조궁 법황 등하(とうか)는 "계미년(622년) 2월 22일"이다.
- 『일본서기』에서 우마야도의 어머니는 "하시다노 황녀", 부인은 "우지노 가이다코 황녀"이지만, 『석가 삼존상 광배명』의 조궁 법황의 어머니는 "오니노마에 태후", 부인은 "간시키노 왕후"로 되어 있다.
4. 8. 평(評)을 제정한 것은 규슈 왜국
「평(評)」을 제정했던 것은 야마토 왕권에 앞선 규슈 왜국이라는 주장이 있다.[41] 일본서기에서는 다이카 개신 때 '군(郡)'이 성립되었다고 기록하지만, 출토된 문서(목간류)에 의해 '군'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다이호 율령이 제정된 몬무 천황 5년(701년) 이후이며, 그 이전에는 '평'을 사용했던 것이 확인되었다.[41]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규슈 연호에서는 다이카 원년이 695년이며, 다이카 개신의 정변으로 규슈 왜국을 대신하여 기나이(畿內) 일본이 정권을 잡고 '평'을 대신하여 '군(郡)'이 사용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 사이메이 7년(661년) 6월과 덴지 7년(688년)에 두 번이나 서거 기사가 있는 이세 왕에 관한 기사는 34년 전의 일이며, 640년대에 규슈 왜국은 평 제도를 수립 개혁했을 가능성이 있다.[42]
- 『이요미시마 연기』에는 "고토쿠 천왕위, 반쇼(番匠) 첫 시작. 조쇼쿠 2무신(戊申), 일본국 어순례 주심."(고토쿠 천황 때, 반쇼(대규모 토목 공사)가 시작되고, 규슈 연호의 조쇼쿠(常色) 2년 무신 (648년)에는 일본국에 어순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고토쿠 천황 때 전기 나니와노미야 조영이 시작되고, 다이카 4년(648년)에 천황이 규슈 왜국에서 기나이 일본국으로 행행하고, 그 도중에 이요에 들렀다는 것이다.
4. 9. 규슈 왜국에서 야마토 왕권
규슈에서 왕권이 이동하여 야마토 왕권이 확립된 것은 7세기 말이라는 주장이 있다.- 고대 국가 성립 요건으로는 상설 정부(관료 기구), 상설 군대, 수도(도성)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토 천황 8년(694년) 이후에야 기나이 지방에서 갖춰졌으며, 그에 반해 규슈에는 노국이나 다자이후 등의 도성이 고대부터 존재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위지왜인전』의 야마이국이 북부 규슈에 있었다는 설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 후 규슈 왜국에서 기나이 일본으로 권력 이동이 있어야 하는데,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 역대 정사에서는 왜에 대한 기술이 일관되어 동일한 국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나라 정사 『구당서』, 『신당서』에서 7세기 말에 국호가 "왜"에서 "일본"으로 바뀌었으므로, 이 시기에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추정하는 데 큰 개연성이 발견된다.[43]
- 『신당서』 시기에 일본의 역사가 개찬·날조되었다는 생각 아래에서는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만엽집에서는 8세기까지 다자이후(왜)를 일본과는 다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술의 혼란에 대해 모순 없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팔방을 다스리는 우리 대왕의 다스리는 나라는 일본도 이곳(다자이후·왜)도 같다고 생각한다(대재상 오토모 타비토 만 6-956).
- 한 문명권에서는 새로 성립한 왕조가 자국의 권력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 전 왕조의 역사서인 "정사"를 편찬하는데, 『일본서기』, 『고사기』는 8세기 초두경에 편찬되었으므로, 야마토 왕권이 확립된 것은 7세기 말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천황기』나 『국기』 등의 6세기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립되지 않는다.
- 일본 각지의 사찰 연기나 지방의 지지·역사서 등에 야마토 왕권 이전에 규슈 왜국이 정했다고 할 수 있는 "규슈 연호"(게이타이 원년(517년) - 다이초 9년(712년))가 다수 발견된다. "규슈 연호" 또한 8세기 초두에 끝나므로, 이 시기에 왕조가 교체되었다고 추정함으로써 모순이 적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일본서기에 따르면 비다쓰 천황 13년(584년)에 기나이에 불교를 전한 것은 하리마에 있던 고구려의 환속 승려 에벤이다. 584년 이전에 이미 하리마에는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것이며, 6세기 말 하리마는 기나이에게는 다른 문화권(= 외국)이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44]
4. 9. 1. 임신의 난
672년 임신의 난의 전투 지역은 규슈 내였다는 주장이 있다.[45] 임신의 난으로 왕조 교체(역성혁명)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50]- 이 시기에 헤이조쿄의 호류지도 소실되었고, 후에 북위의 양식으로 재건되었으므로, 난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 이 난에서는 오이타노 에사카, 오이타노 와카오미 등의 규슈 호족들이 활약했다. 또한, 오아마노 왕자는 규슈 호족인 무나카타 씨의 딸(무나카타 아마코노 무스메)을 비로 삼았다. 도고쿠 호족은 고려 대상이 아니기에 억지 근거로 사용한다.
- 오쓰쿄는 오미 오쓰(오쓰시)가 아니라, 히고 오쓰(오쓰마치)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오미 오쓰 부근에는 궁을 설치할 만한 넓은 토지가 없지만, 히고 오쓰 부근은 조방제의 흔적으로 보이는 동서와 남북으로 직교하는 길이 남아 있는 넓은 평야가 존재한다.
- 시가현 세타강에 걸린 세타의 당교는 장대하여, 일본서기의 기술처럼 임신의 난에서 갑옷을 겹쳐 입고 칼을 뽑아 돌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오쓰마치 세타 부근의 시라카와에 걸려 있었다면 다리는 짧아지고 기술대로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
- 오미 오쓰에서는 오쓰쿄로의 천도 이유 설명이 곤란하다. 히고 오쓰라면 "백촌강 전투"의 패전으로 인한 당나라 군의 침공에 대비, 다자이후에서 내륙부 오쓰쿄로 수도를 옮겼다고 설명할 수 있다.[46]
- 오쓰마치 북쪽 기쿠카 분지는 고대에 시카노우라라고 불린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고 한다. → 단카이
- 오이타현에는 다케다, 미에, 오노, 이누카이, 사에키 등 임신의 난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 위 주장이 옳다면, 후와의 길은 다케다시 부근 가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 후와세키
- 다케다시에는 서쪽에서 길이 모여 있고, 일본서기 기술대로 쳐들어오는 적의 각개 격파가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후난코구이 등 임신의 난에 연유한 풍습이 남아 있는 곳은 사가현가시마이다.
- 겐지가 하치만 신을 씨족신으로 삼아 모신 것에서, 하치만 신이 군신이 되었다고 한다. 겐지가 하치만 신을 군신으로 씨족신으로 모신 것은 임신의 난 때 우사 신궁과의 관계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47]
- 위 주장이 옳다면, 승패를 결정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미노에서 온 원군은 기나이 일본국이 미노나 야마토 주변에서 소집하여 규슈 왜국으로 파견한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더욱이, 『일본서기』에 기록된 릿타산이나 오사카 산은 규슈 내 산이며, 난바는 지쿠고 평야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48] → 난바
- 『일본서기』 덴무 8년(679년) 11월 조에 "처음 관을 다쓰다산, 오사카 산에 둔다. 이에 난바에 라성을 쌓는다"라고 있다. 가미마치다이치의 난바궁에 라성(성벽)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 다음 사항들로부터 난바(진)는 가미마치다이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도 큰 모순은 없을 것이다.
- 가미마치다이치 북단・도시마치고라이바시 주변은 헤이안 시대에 와타나베노쓰라고 불렸다.
- 『일본서기』에는 진무가 세토 내해를 거쳐 도착한 곳은 "나니와노쿠니・나니와"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지키』에서도 "나니와"라고 기록하고 있다. 왕인의 고사를 무시한다면, 오사카시 난바는 원래 나니와라고 불렸고, 난바는 후세에 인위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 닌토쿠기에 기록된 "난바의 호리에"는 인공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여겨지지만,[49] 가미마치다이치 북단, 현재 오사카성 북쪽 수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야요이 시대에는 존재했음이 확인되었고, 인공적으로 굴착된 것은 아니다.
- 가미마치다이는 7세기 무렵까지 오사카만과 가와치호에 끼인 사주였으며, 협소하여 많은 주민이 살 수 있는 토지도 없었고, 야마토 왕권 본거지인 야마토에서 멀리 떨어진 벽지였으므로, 닌토쿠 천황이 난바 다카쓰노미야, 고토쿠 천황이 난바 나가라노도요사키노미야 등 궁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 나가라노도요사키노미야까지의 "난바"는 지쿠고강 하구(지쿠고 평야) 부근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야나가와시 내에는 나가라([https://www.google.co.jp/maps/place/%E3%80%92832-0034+%E7%A6%8F%E5%B2%A1%E7%9C%8C%E6%9F%B3%E5%B7%9D%E5%B8%82%E5%8C%97%E9%95%B7%E6%9F%84%E7%94%BA/@33.1647544,130.4077331,17z/data=!3m1!4b1!4m5!3m4!1s0x3541b34a6c7555d5:0x6be3d910869cc45c!8m2!3d33.164636!4d130.409936 북 나가라마치]・[https://www.google.co.jp/maps/place/%E3%80%92832-0033+%E7%A6%8F%E5%B2%A1%E7%9C%8C%E6%9F%B3%E5%B7%9D%E5%B8%82%E5%8D%97%E9%95%B7%E6%9F%84%E7%94%BA/@33.1632128,130.4076536,17z/data=!3m1!4b1!4m5!3m4!1s0x3541b34a920d2a55:0x30cf81ddf2dc8b82!8m2!3d33.1631251!4d130.4096943 남 나가라마치])라는 지명이 있고, 구루메시 내에는 [https://www.google.co.jp/maps/place/%E9%AB%98%E6%B4%A5%EF%BC%88%E3%83%90%E3%82%B9%EF%BC%89/@33.248625,130.3804179,13z/data=!4m5!3m4!1s0x3541b16c8206deab:0xe49d731cd775113!8m2!3d33.2510835!4d130.415984?hl=ja 다카쓰]라는 지명도 있다. 미즈마군오키마치에는 오스미([https://www.google.co.jp/maps/place/%E3%80%92830-0403+%E7%A6%8F%E5%B2%A1%E7%9C%8C%E4%B8%89%E6%BD%B4%E9%83%A1%E5%A4%A7%E6%9C%A8%E7%94%BA%E5%A4%A7%E8%A7%92/@33.2261424,130.4431631,15z/data=!3m1!4b1!4m5!3m4!1s0x3541b1f34a0c2573:0x3a90a9f71e33a618!8m2!3d33.2265751!4d130.445935 오스미])라는 지명도 있다. 사가시에는 [https://www.google.co.jp/maps/place/%E3%80%92840-2204+%E4%BD%90%E8%B3%80%E7%9C%8C%E4%BD%90%E8%B3%80%E5%B8%82%E5%B7%9D%E5%89%AF%E7%94%BA%E5%A4%A7%E5%AD%97%E8%A5%BF%E5%8F%A4%E8%B3%80+%E9%B0%A3%E6%B1%9F%E3%82%B3%E3%83%9F%E3%83%A5%E3%83%8B%E3%83%86%E3%82%A3%E3%83%BC%E3%82%BB%E3%83%B3%E3%82%BF%E3%83%BC/@33.2055628,130.3218277,17z/data=!3m1!4b1!4m5!3m4!1s0x3541b545de4acd37:0xe28b493c4e9630ca!8m2!3d33.2055668!4d130.3240364 시쿠쓰에] (祝津江)라는 지명이 있어, 고대 난바에 있던 궁 이름이 모두 있다.
- 오사카부에는 칸자키강, 오카와, [https://www.google.co.jp/maps/place/%E3%80%92569-0853+%E5%A4%A7%E9%98%AA%E5%BA%9C%E9%AB%98%E6%A7%BB%E5%B8%82%E6%9F%B3%E5%B7%9D%E7%94%BA/@34.8237035,135.5876946,16z/data=!3m1!4b1!4m5!3m4!1s0x6000e2a5589672bf:0x184e630bbd012828!8m2!3d34.8234579!4d135.5918495 야나가와마치], [https://www.google.co.jp/maps/place/%E3%80%92598-0023+%E5%A4%A7%E9%98%AA%E5%BA%9C%E6%B3%89%E4%BD%90%E9%87%8E%E5%B8%82%E5%A4%A7%E6%9C%A8/@34.3471722,135.3482841,13z/data=!3m1!4b1!4m5!3m4!1s0x6000cc7d26308991:0xb02736d8dd73af6f!8m2!3d34.3521161!4d135.3719005 오키] 등 지쿠고강 하구에 있는 지명(칸자키시, 오카와시, 야나가와시, 오키마치)과 같은 지명이 있다. 난바 지명 이식에 따라 동시에 이식되었다고 생각해도 특별한 모순은 없다.
- 지쿠고강 중류역은 이와이(부레쓰 천황)가 도읍을 두었다는 상상을 하면, 왜국 중심부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더 상상하면, 오진 천황, 닌토쿠 천황, 킨메이 천황, 고토쿠 천황 등 역대 천황이 도읍을 두었을지도 모른다.
- 닛치라는 난바에서 암살되어 오고리 서쪽 둔덕에 일단 가매장되었다고 한다. 가매장지인 오고리는 난바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생각되지만, 가와치국에는 오고리가 없다. 오고리시가 있는 것은 지쿠고 평야이다. 다만 오고리 지명은 당시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 "임신의 난" 종식 시 "오토모노 후키오"가 "난바 오고리"에서 "난바 이서 국사"들로부터 "관약 역령 전인" 즉 "세창" 등 열쇠나 "관도" 사용에 필요한 "령"이나 "인" 등을 압수하고 있다. "임신의 난"은 20일 정도로 종식되었으며, 만약 난바가 가미마치다이치였다면 20일 정도로 멀리 떨어진 규슈 등 국사들에게 명령을 전달하여 가미마치다이치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목적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난바 오고리"가 지쿠고 "오고리"라면 "난바 이서 국"은 규슈 내 국사들 일이 되어 지쿠고 "오고리"로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적에게 협력한 국사들 해임이라는 추측이 성립한다.
- 고대 지쿠고강은 바다가 내륙까지 들어와 배로 중류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고대 난바에는 야소시마라고 불릴 정도로 섬이 많았다고 여겨지지만, 가와치호는 가미마치다이치에 가로막혀 섬이 형성될 여지는 객관적으로 적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지쿠고 하구는 거대한 삼각주이며, 육화 과정에서 수많은 중주가 형성되었으며, 아리아케해는 조수 간만 차가 큰 바다이므로 조수가 빠진 상태에서는 더 많은 주가 출현한다.
다음 내용으로 보아 임신(壬申)의 난으로 왕조 교체(역성혁명)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50]
- 『고사기』나 『일본서기』에는 동부동모(同父同母) 덴지 천황이 "형"이고 덴무 천황이 "아우"라고 적혀 있지만, 덴지 천황은 덴지 천황 10년(671년)에 46세로 붕어했고, 덴무 천황은 덴무 천황 15년/주조 원년(686년)에 65세로 붕어했으므로 덴무 천황이 4살 연상이다. 또한 덴무 천황은 덴지 천황 딸을 4명이나 비(妃)로 삼았으므로, 덴무 천황과 덴지 천황이 형제일 수는 없다.
- 덴무 천황은 임신(壬申)의 난 때, 자신을 백성(협객) 출신 한(漢)나라 고조 유방에 비유하여 유방과 같은 붉은 깃발을 사용했지만, 가족 간 다툼에서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
- "덴지 천황"은 ([은(殷)]) 마지막 폭군으로 여겨지는 ([주(紂)])가 사랑한 "덴지옥(天智玉)"에서 유래했고, "덴무 천황"은 "하늘은 무왕(武王)을 세워 악한 왕 주왕(紂王)을 멸했다"에서 유래한다. "덴지 천황"·"덴무 천황" 시호는 은(殷) 왕조에서 주 왕조로 역성혁명을 의식하고 붙여졌다(모리 오가이 『제시고(帝謚考)』).
〈사서의 국호 개칭 기사〉
; 『구당서』 권199상 열전 제149상 동이 왜국 일본국
: "일본국(日本國)은 왜국(倭國) 별종이다. 그 나라가 해 뜨는 곳에 있기에 일본(日本)을 이름으로 삼았다. 혹은 왜국(倭國)이 스스로 그 이름이 세련되지 않았다고 여겨 일본(日本)으로 고쳤다고 한다. 혹은 일본(日本)은 옛날 작은 나라로 왜국(倭國) 땅을 병합했다고 한다."
; 『구당서』 권220 열전 제145 동이 일본
: "왜(倭)라는 이름을 싫어하여 일본(日本)으로 개칭하도록 했다. 사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가 해 뜨는 곳에 있기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혹은 일본(日本)은 작은 나라로 왜(倭)에게 병합되었기에 그 호칭을 모방했다는 설도 있다. 사자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의심스럽게 여겼다."
- 『구당서』에는 왜(倭) 혹은 일본(日本)에 대해 『왜국전』과 『일본국전』 두 기사가 세워져 있다. 이것은 규슈 왜국(九州倭國)과 기내 일본(畿內日本)은 다른 나라이며, 규슈가 기내에 의해 정복되었고, 야마토 왕권(大和王権)이 일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43][51] 즉, 왜(倭) (규슈)와 일본(日本) (기내)은 다른 나라이며, 규슈 왜국(九州倭國)이 기내 일본(畿內日本)에 의해 정복되었고, 야마토 왕권(大和王権)이 일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52]
- 천황가(天皇家) 가장 중요한 제사인 다이조사이(大嘗祭)는 덴무 천황 2년(673년)까지 행해지지 않았다. 그전까지 야마토 조정에는 정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 덴무 천황 2년(673년) 8월 조에, "조(詔)로 탐라(耽羅) 사자에게 이르기를. 천황(天皇)이 새롭게 천하를 평정하고 처음으로 즉위한다. 이로 인해 축하 사자는 받지만 그 외는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며 "조(詔)로 탐라국 사자에게 이르기를. 천황이 새롭게 천하를 평정하고 처음으로 즉위한다. 그러므로 축하 사자는 받아들이지만 그 외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 한(漢) 문명권에서는 새롭게 흥한 왕조가 멸망한 전(前) 왕조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통례인데, 덴무(天武)가 역사 편찬을 명한 것은 덴무 천황 10년(681년)이다.
- 『일본서기』에 따르면 덴무는, 삼종신기 중 하나인 쿠사나기노 검(草薙剣)에 씌었기 때문에, 덴무는 본래 정당한 후계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 10. 다자이후(왜경)
다자이후는 규슈 왜국의 수도(왜경)였다고 생각하면 많은 문헌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53]- "다자이"의 본래 의미는 재상(총리대신)이며, "다자이후"는 "정치를 행하는 곳", 즉 "수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송에 조공했던 왜왕 무는 황제의 최고위 신하(다자이)를 자칭했다.[54]
- 다자이후는 "멀리 떨어진 조정(とおのみかど)"이라고 불렸지만, "멀리 떨어진 조정"은 "멀리 떨어진 수도"라는 의미이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거리적으로 멀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옛 수도라는 의미이다.[55][56]
- 다자이후에는 "자신전", "내리", "주작문"과 같은 지명 자가 남아 있어, 다자이후에 "천자의 거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57]
- 다자이후 정청(政庁) 유적은 2022년에도 도후로(都府楼) 유적으로 불리고 있지만 석비에는 "도독부루 유적(都督府楼跡)"이라고 쓰여 있어, 본래는 도독부(都督府)라고 불렸다.[58] 도독부란 중국의 관직인 도독에 임명된 자가 있는 곳이다. 7세기까지 전국 각지에 평독이 설치되었음이 밝혀졌는데, 평독이란 도독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자이다.
- 『일본서기』 등 야마토 왕권의 사서에는 다자이후를 언제 설치했는지 기록이 없다. 또한 도성 자체의 건설 기록도 없다.
- 고대 방위 시설 유적의 배치는 북큐슈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켜야 할 중심이 기나이 특히 야마토가 아니라 다자이후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즈키나 소재가 명확한 고대 산성은 북큐슈에 많다. 또한 야마토 왕권에 축성 기록이 없는 고대 산성인 "고노고이시(신령석)식 산성"이 북큐슈에서 세토 내해 연안에 존재하지만, 고노고이시식 산성의 대부분도 북큐슈에 집중되어 있다).
- 진고케이운 3년(769년) 10월의 기사에서 다자이후의 관리가 수도에 "이 부는 사람들의 왕래와 교역이 성행하여, 천하 제일의 도회입니다."라고 보고한 것처럼 다자이후는 국제 무역 도시였고, 관리 정도만 살았던 후지와라쿄나 헤이조쿄 등 야마토 왕권의 수도를 능가하며, 고대 일본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였다.
- 『일본서기』 임신(닌신)의 난 (672년)의 기사에 "왜경"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이 시기에는 기나이 지방에는 아직 경이라고 부를 만한 도시는 없었고(아스카궁 등은 궁궐만 있고 시가지는 없다). 이것은 당시 일본에 존재했던 유일한 도시인 '''다자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만엽집』에 다자이쇼니 오노오이(小野老) 아손이 덴표 원년(729년) 다자이후에 부임했을 때, 연회에서 "나라의 수도"를 그리워하며 읊었다는 다음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다자이후의 번영을 읊은 것으로, 다자이후의 번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오니요시 네이라노미야코와 사쿠하나노 니호후가고토쿠 이마사카리나리 (아오니요시, 나라의 수도는 피어나는 꽃의 향기처럼 지금 한창 번성하네) 만3-238"
- 통설에서는 약 300년에 걸쳐 당초 계획에 따라 계속 건설되었다고 하지만, 단순한 구획 정리 사업에 지나지 않아 "수개월에서 수년으로 가능한 조방 건설에 어째서 300년이나 걸렸는가?", "300년이나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실시한 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등 의문과 모순이 발생한다.
- 현재의 다자이후의 연대 측정은 연륜 연대 측정이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다. 미즈키의 축성은 이과적 측정을 따르면 하부는 서기 240년, 중부는 서기 430년, 상부는 서기 660년이며, 미즈키의 배수구의 목부도 서기 430년이었으므로, 『일본서기』의 기술 등보다 오래되어 다자이후 본체도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로칸의 변소에서는 화장지 대신 사용된 서기 430년의 목편도 발견되었다.
- 가쿠슈인 대학 연대 측정실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1968년 (쇼와 43년)에 다자이후 유적에서 다케우치 리조 교수가 발견한 소토층은 1600년 정도 전의 것이다.
5. 관련 주장
- 기원전부터 7세기 말까지 일본을 대표한 정권은 규슈에 있었으며, 왜(ゐ), 대왜(たゐ), 俀중국어(たゐ)라고 불렸다.[5]
- 1세기에는 왜노국(왜국)이 북부 규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성립하여, 왜노국왕(왜왕)은 하카타만 근처에 수도를 두고 한에 조공하여 "한위노국왕" 금인을 받았다.
- 왜왕 히미코(히미카)는 이토국에 도읍을 정했고, 왜국은 후쿠오카 평야의 노국(당시로서는 대도시인 2만 호)을 중심으로 했다.[6] 한이 멸망하고 위가 흥기하면서, "한위노국왕"의 금인 대신 위로부터 "친위왜왕"의 금인이 수여되었다.
- 히미코는 쓰쿠시군의 조상인 미카요리히메 (甕依姫)이다. 이요(ゐよ)는 한풍의 이름(왜여)을 칭한 최초의 왜왕이다.
- 왜의 5왕(찬, 진, 제, 흥, 무)도 규슈 왜국의 왕이며, 각각 왜찬, 왜진, 왜제, 왜흥, 왜무로 칭했다.
- 쓰쿠시군 이와이(와이)는 왜(규슈)의 왕(부열천황)이며, 게이타이는 규슈 남부의 호족이다. 이와이의 난은 규슈 왜국에서 게이타이가 반란을 일으켜 부열조를 무력으로 토벌한 기사이다.[7]
- 규슈 왜국의 게이타이조에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연호(규슈 연호)가 세워졌다.
- 수 왕조와 대등한 외교를 한 俀중국어왕 성 아매 자 다리사북고 호 아배계일본어미[8]는 규슈 왜국의 왜왕이었다.
- 다자이후는 왜경 원년(618년)부터 규슈 왜국의 멸망까지 왜경이라고 불리는 규슈 왜국의 도읍이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풍수의 사신응을 고려한 계획 도시였다.
- "백촌강 전투"에서는 총사령관인 규슈 왜국의 천황 "쓰쿠시군 사치야마 (사치야마・왜사)"가 당군의 포로가 됨으로써 규슈 왜국은 패배했다.
- "임신(닌신)의 난"은 기내(킨나이)가 아니라 규슈를 무대로 했으며, 난 전해에 당군의 포로에서 풀려나 왜(규슈)로 귀국한 사치야마(실은 천황의 다카이치 황자)와 사치야마가 부재 중일 때 정무를 대행하던 중궁 천황(토치노 황녀)-오토모 황자(고분천황)의 대립에 기내의 호족 오아마 황자(덴무천황)가 개입하여 일본 열도의 패권을 얻은 사건이며, 승패를 결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노로부터의 원군은 기내 일본군이다.
- "임신의 난"에서 규슈 왜국의 천황 (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은 오아마 황자(덴무)의 힘을 빌려 오토모 황자에게 승리했지만, 협력을 얻기 위해 요시노의 맹약에서 오아마 황자(덴무)와 규슈 왜국 계열의 우노노사라라 황녀(지토천황) 사이의 아들(구사카베 황자)을 후계자의 황태자로 삼았다. 전란으로 규슈의 유력 호족 대부분이 멸망하여 천황(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전란과 그에 따른 천재지변[9]으로 황폐화된 규슈에서 덴무의 세력권인 기내로 천황 (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은 옮겨갔다.
- "다이카 개신(을사의 변)"은 황태자였던 구사카베 황자가 즉위하지 못하고 서거했기 때문에 다음 황위에 누가 오를지 불분명해지고, 의심에 휩싸인 구사카베 황자의 아들인 가루 황자(몬무천황)와 나카토미노 가마타리(후지와라노 후히토와 동일 인물)가 규슈 연호의 다이카(다이카) 원년(695년)에 후지와라쿄에서 천황 (다카이치 황자 = 사치야마)과 그의 아들을 암살하고, 다음 해 다이카 2년(696년)에 가루 황자(몬무천황)가 즉위한 사건이다.
- 진무천황 동정은 6세기에 임나 멸망 등으로 발생한 난민의 일부가 규슈에서 동정한 것으로, 먼저 규슈에서 기내에 식민하여 거대한 고분을 축조했던 니기하야히노미코토가 지배하는 나가스네히코 등의 나라인 히가시(일본)를 정복한 것이다. 통설에서 아스카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까지는, 야마토 왕권(일본・히가시)은 아직 일본을 대표하는 정권이 아니었고 기내의 지방정권에 불과했지만, 몬무의 시대에 규슈 왜국으로부터 정권을 완전히 빼앗아 일본 전체가 "일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 고지키・일본서기는 규슈 왜국의 역사서이며, 쇼쿠니혼기는 덴무조의 역사서이다. 기기에 기록된 천황 중 초대 진무천황과 제9대까지의 결사팔대의 천황 및 제40대 덴무천황과 제41대 지토천황, 쇼쿠니혼기에 기록된 제42대 몬무천황부터 제48대 고켄천황까지 7대, 총 18대만이 덴무조에 이어진 계보이다. 기기에 기록된 덴무계의 천황은 천황이 아니라 기내의 지방 호족에 불과했다. 기기에 기록된 그 밖의 천황은 규슈 왜국의 천황이다.
- 만엽집의 노래 등도 8세기까지의 오래된 것은 대부분 규슈에서 읊어진 것이다.
- 진키 6년(729년) 후지와라 씨는 규슈 왜국 계열인 나가야 왕을 나가야 왕의 변에서 말살했다.
- 제3회 신궁식년천궁(진키 6년/덴표 원년(729년) - 덴표 4년(732년))에 의해 이세 신궁이 야쓰시로시에서 이세시로 옮겨졌다.
- 진고케이운 4년(770년) 쇼토쿠천황 암살로 덴무조가 단절되고, 후지와라 씨는 멸망한 규슈 왜국의 말예(고닌천황)를 천황으로 옹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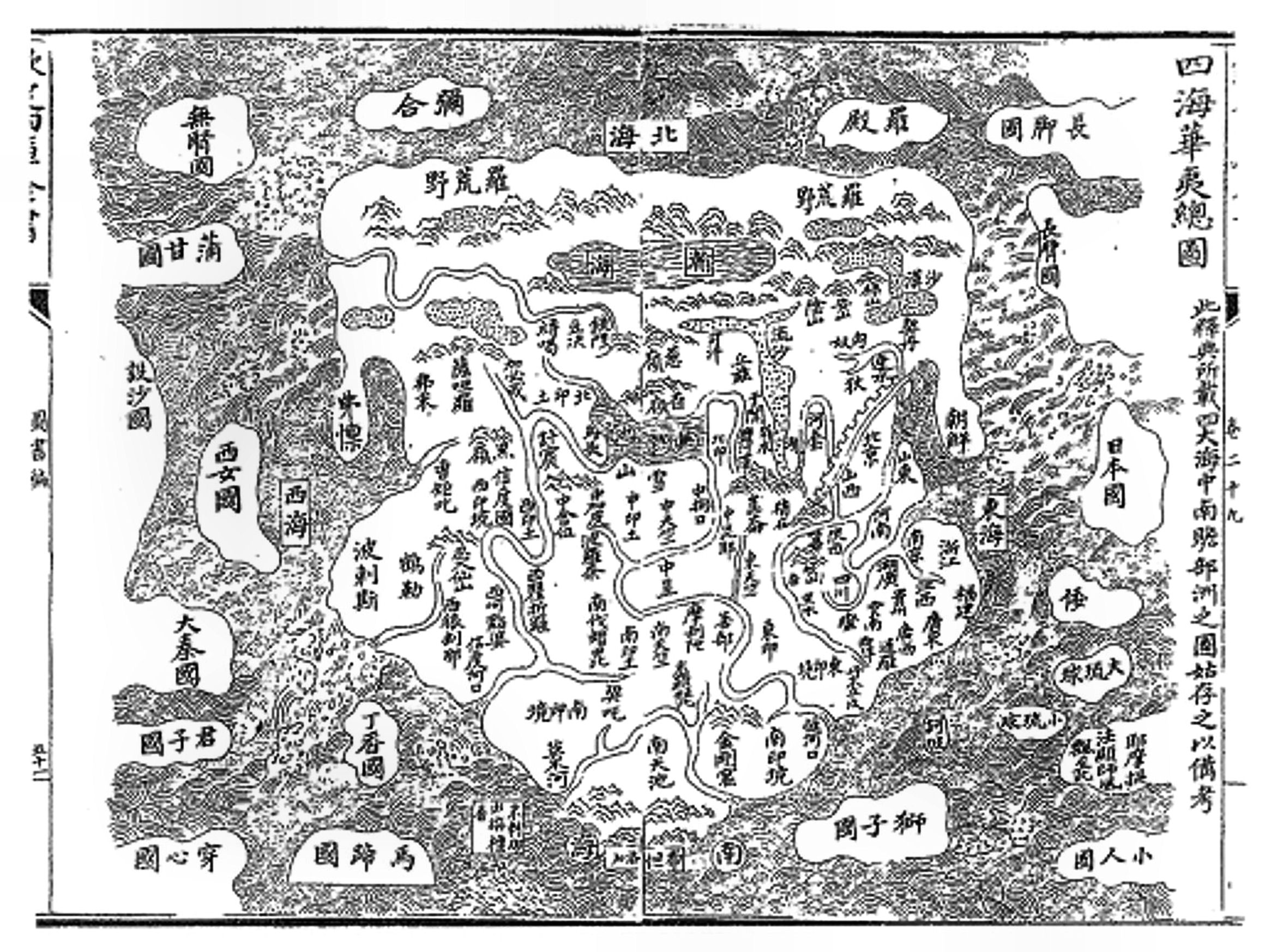
6. 결론 및 비판적 고찰
규슈 왕조설은 일본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고고학적 증거 부족: 규슈 왕조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 사료 해석의 자의성: 《고사기》, 《일본서기》 등 사료 해석이 자의적이며, 기존 학설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후루타 타케히코(古田武彦)와 그의 지지자들은 사료 비판 등 역사학의 기초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79] 또한, 후루타 타케히코의 한문 해석이 임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80]
- 기존 학설과의 충돌: 규슈 왕조설은 기존의 일본 고대사 학계의 연구 성과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78] 중요 고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81]
- 임나일본부설과의 연관성: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규슈 왕조설은 임나일본부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족주의적 역사관 경계: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는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경계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참조
[1]
서적
邪馬台国論争
岩波書店
2006
[2]
간행물
九州王朝の史料批判
2006-02
[3]
문서
"[[九州王朝の二都制]]」「[[唐軍の北九州進駐]]」などは、執筆者の判断によって省略した。古田による邪馬台国説を改良、「壬申の乱九州内説」を採用、「[[大化の改新]]」の解釈を加え、九州倭国の滅亡・ヤマト王権の成立を[[文武天皇]]5年([[701年]])ではなく[[持統天皇]]9年([[695年]])とした(「乙巳の変」による政権簒奪時を政権交代時とした)。神武東征の時期を[[5世紀]] 〜 [[6世紀]]とし、[[欠史八代]]の時期を[[古墳時代|古墳時代後期]] 〜 [[飛鳥時代]]とした。[[#問題点]]で批判のあるような『通典』の解釈・古田による『魏志倭人伝』邪馬台国への所要日数(水行十日陸行一月)についての解釈なども省略した。そのほかにも古田武彦と違う面がある。
[4]
웹사이트
新春講演会の挨拶
http://koganikki.fur[...]
[5]
서적
漢字語源辞典
학등사
1965
[6]
문서
"[[魏志倭人伝]]」に見える[[3世紀]]の「邪馬壹国」([[邪馬台国]])を記録どおり「邪馬壹国」とする([[邪馬壹国説]])。古田は、魏志倭人伝など古い記録は、邪馬壹国であり邪馬臺国の表記は誤り、邪馬壹国(やまいちこく)であるとしているが、[[後漢書]]倭伝に「邪摩惟(やまたい)」、[[隋書]]{{補助漢字フォント|俀}}伝に「邪靡堆(やまたい)」等とあることから、[[陳 (南朝)|南朝]]滅亡後の倭(ゐ) → 大倭・{{補助漢字フォント|俀}}(たゐ)への変化に伴い邪馬壹国 → 邪馬臺国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7]
문서
古田は当初、「磐井の乱」を[[畿内]]ヤマトの九州倭国に対する反乱とみていたが、最近は無かったと見ている。
[8]
문서
「姓は阿毎(アメ・アマ「天」)、字は多利思北(または比)孤(タリシホコ、「足彦」タラシヒコ)、阿輩鶏弥(オホキミ「大王・アメキミ説あり」)と号す」([[※]]「大王」の使用例 [[伊予国風土記逸文]](「釈日本紀」)「法興六年十月歳在丙辰我'''法王大王'''与慧慈法師及葛城臣」万葉集 雑歌 [[柿本人麻呂|柿本朝臣人麻呂]]「八隅知之 吾'''大王''' 高光 吾日乃皇子乃 馬並而」)
[9]
문서
"[[筑紫地震]]([[678年]]):[[水縄断層]]系が起震断層とされ[[マグニチュード]]6.5〜7.5だったと推定されている。"
678
[10]
웹사이트
「磐井の乱」はなかった
http://www.furutasig[...]
[11]
서적
扶桑国は関西にあった
[12]
웹사이트
大化改新批判
http://www.furutasig[...]
[13]
웹사이트
「法華義疏」の史料批判
http://www.furutasig[...]
[14]
서적
倭国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2〉
吉川弘文館
2002-07-01
[15]
서적
失われた九州王朝
朝日新聞社
1993-01
[16]
문서
「漢匈奴悪適尸逐王」の印を「漢の匈奴の悪適尸逐の王」と読み三段の国名の例が存在するとの意見もあるが、「悪適尸逐王」は匈奴の王号であり二段の国名である。また、この印は銅印である。
[17]
문서
*「旧唐書倭国伝」倭国は、古(いにしえ)の倭奴国である。 *「新唐書日本伝」日本は、古(いにしえ)の倭奴国である。 *「宋史日本国伝」日本国は、もとは倭奴国であった。 *「元史日本伝」 日本国は東海の東に位置し、昔は倭奴国と称した。 *「明史日本伝」 日本は、古(いにしえ)の倭奴国である。
[18]
문서
この解釈は古田の解釈とは異なる
[19]
문서
漢書(前漢書)』地理志の「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 以歳時來獻見云」・「楽浪海沖に倭人が現れる。100か国余りに分かれているが、季節になると貢物を持って挨拶に来る。と云う。」から前漢の時代は100国あまりの小国分立の状態であったのが『後漢書』東夷傳では「自武帝滅朝鮮 使驛通於漢者三十許國 國皆稱王 世世傳統」「武帝が朝鮮を滅ぼして以来、30国ていどが漢と交流している。(それらの)国は全て代々王を称することを伝統としている。」となり国の数が30国あまりに減り統一が進むと共に、一時的に自称王が乱立していたことが察せられる。倭奴国は自己の申告により漢の皇帝から家臣としての王に任命されたもので倭国内の統治の実態は不明だが、王を自称していた他の30あまりの国にから異議が無いところから建武中元二年までに倭国内の他の国々の自称王を降し、初めて倭国を統一した者である可能性があると仮定する。この後「桓 靈間 倭國大亂 更相攻伐 歴年無主」・「桓帝と霊帝の間、倭国が内戦状態になり、互いに攻め合い。長い間、君主が居なかった。」となり再び統一が乱れたことが察せられる。
[20]
문서
後漢書に「[[57年|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安帝[[107年|永初元年]]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建武中元2年に倭奴國が朝貢してきた。使いの者は大夫と自称した。倭奴國は倭國の最南端である。'''光武帝は印章を授けた。'''安帝永初元年に倭國王の'帥升等が奴隷160人を献上して謁見を願ってきた。」とある。倭国が倭奴国と区別されており、倭奴国について「倭國之極南界也」とあることから倭奴国は倭国の一部であると考えられる。王については倭国の王、帥升(等)しか記されず倭奴国の王については記されていないことから、建武中元二年に「倭國之極南界」に在った倭奴国が使いを遣し漢より印を綬かって倭国全体の王に任ぜられ、倭国王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57
[21]
문서
「ゐ」は隋唐音であり、「倭」「委」はともに「わ」であるとする反論もある。
[22]
문서
"[[チョッパリ#チョッパリ以外の日本人への蔑称]]"
[23]
문서
「倭奴」は日本の蔑称であり、しかも金印には「倭」の字が減筆されニンベンの無い「委」が用いられている([[新]]の[[王莽]]が[[匈奴]]に与えた「新匈奴單于章」の金印と同じ「漢の皇帝が属国の蛮王に与えた印」という侮辱的印と同じ)。
[24]
문서
"[[丹生川上神社#歴史]]。"
[25]
웹사이트
銅釧鋳型(どうくしろ いがた) 福岡市多田羅大牟田遺跡
http://emuseum.nich.[...]
[26]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27]
문서
倭(日本)による朝鮮半島への進出は、366年に百済と同盟してから663年の白村江での唐・新羅との戦いを経て668年の高句麗の滅亡までの303年間で、倭(日本) が政治・軍事・外交面で朝鮮半島に関わった年次は81回にも及ぶ。これは4年に1回の割合でほとんど300年の間、連続的に起こっており、また倭(日本)は万余の大軍を朝鮮半島に送り続けたことが記録されている([[三韓征伐#概史・年表]])。九州王朝説でも九州では軍事が民生を圧迫していたと考えるが、九州の勢力は独自に軍事活動を行っていたと仮定する。
[28]
문서
(1)出現期の前方後円墳の分布の中心は近畿の大和(2)出現期の前方後円墳の分布は瀬戸内海沿岸各地から北部九州。(3)九州南部では東西に[[地下式横穴墓]]、[[板石積石棺墓|地下式板石積石室墓]]という二大分布圏が存在。前方後円墳は沿岸部のみに分布する。(4)古墳時代前期後半に東日本、近畿、西日本各地で前方後方墳から前方後円墳への転換が確認されている。(5)3世紀中葉すぎ、[[近畿地方|近畿]]、[[中国地方]] → 北部九州への土器の移動が顕著に認められる。逆の動きはほとんど認められない。(参考 → [http://www.inuyama.gr.jp/ssinfo/contents/aotsuka/shinpo/shinpo7.html 「前方後円墳と前方後方墳」 白石太一郎講演] {{링크切れ|date= 2021年2月}}))等を根拠であるとする反論。
[29]
문서
"[[現在]]でも、九州の北西部に広がる海域を[[玄界灘]]と言う。「玄」は「[[玄武]]」と同様に「北」の意味であり、玄界灘とは(荒い)北の海を意味する。なお、日本書紀にも2か所「北海」の表記はあるが、これは古代の言い回しとしてはあまりに機能的であり、あるいはむしろ九州倭国の史書からの盗用であると疑うことにも正当性が見えてくるであろう。"
[30]
문서
根拠はないが、[[倭王武]]が九州倭国の王であるとすると、古事記や日本書紀が伝えるところの「ニニギノミコト」・「ヒコホホデミノミコト(山幸彦)」・「ウガヤフキアエズノミコト」は九州倭国の[[人間]]で、そこから東征に派遣された「カムヤマトイワレヒコノミコト(神武天皇)」の[[親族|子孫]]が巨大[[古墳]]を築造した畿内日本であることになる。[[多元王朝説]](古田武彦)は神武東征は単なる神話ではなく史実の反映であり、神武が畿内に入植したのは[[2世紀]]の頃ではないかと推定している。九州倭国は半島等での軍事活動で疲弊し[[高句麗]]のような強力な競争相手のいない新天地に入植した神武の子孫畿内日本はその後も東征を続け発展に向かい、[[近畿地方]]から[[東日本]]にかけて大勢力を築いたと推察することも可能であろう。
[31]
문서
"[[戦国時代 (日本)|戦国時代]]でも[[文禄・慶長の役|朝鮮出兵]]に際して[[豊臣秀吉]]は、肥前[[名護屋城]]を築城しそこから指揮を執っている。[[明治]]になっても[[日清戦争]]に際して日本政府は、[[大本営]]と首都機能を[[広島市]]に移して戦っている。"
[32]
문서
第1回遣隋使派遣は『日本書紀』に記載がなく『隋書』にあるのみ、また『日本書紀』では遣隋使のことが「[[遣唐使]]」となっている。
[33]
문서
『隋書』にある600年の第一回遣隋使は『日本書紀』に全く記載がなく、第二回の607年の遣隋使も隋ではなく大唐国に派遣したと記している。唐は618年に建国しており607年は隋代である。極めて可能性は低いが、「『唐土』としての『大唐』ではなく、王朝としての『唐』に行った」とすると618年以後のことと仮定することはできる。『日本書紀』の記す第二回遣隋使は実は唐代の619年であり、『日本書紀』では年代を12年繰り上げた為に隋代を大唐国と書い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仮定する。そうすると、607年の遣隋使は九州倭国の派遣したもので、隋の[[従八品]][[文林郎]]の[[裴世清]]は{{補助漢字フォント|俀}}国に来たのであり、619年にも唐の家臣となり降格した後の[[正九品]][[鴻臚寺]]の[[掌客]]の裴世清が[[小野妹子]]と供に来たと
[36]
문서
[37]
문서
[38]
문서
[39]
문서
[40]
문서
[41]
문서
[42]
문서
[43]
문서
[44]
문서
[45]
서적
壬申の乱の舞台を歩く 九州王朝説
2012-12-25
[46]
웹사이트
古田史学会報 81号 伊倉2 天子宮は誰を祀るか 古川清久
http://www.furutasig[...]
[47]
문서
[48]
문서
[49]
문서
[50]
서적
倭国と日本古代史の謎
学研M文庫
2006-06-01
[51]
문서
[52]
문서
[53]
서적
太宰府は日本の首都だった
ミネルヴァ書房
2000-07-01
[54]
문서
[55]
문서
[56]
문서
[57]
문서
[58]
문서
[59]
웹사이트
一大率
[60]
웹사이트
古代のお金
http://museum.city.f[...]
[61]
서적
古代史の十字路 万葉批判
東洋書林
2001-04-20
[62]
간행물
古田史学論集 第十一集「古代に真実を求めて」
明石書店
2008-03-01
[63]
웹사이트
『天孫降臨地の解明』古田武彦
http://www.furutasig[...]
[64]
서적
法隆寺は移築された
新泉社
2007-02-01
[65]
서적
盗まれた神話
[66]
문서
[67]
문서
[68]
서적
奪われた国歌「君が代」
株式会社情報センター出版局
2008-08-11
[69]
웹사이트
古田武彦氏講演会(四月十七日) 抄録
http://www.furutasig[...]
[70]
서적
太宰府・宝満・沖ノ島
不知火書房
2014-08-01
[71]
서적
ここに古代王朝ありき
ミネルヴァ書房
2010-09
[72]
서적
続・法隆寺は移築された「源氏物語」は筑紫が舞台だ
[73]
서적
和姓に井真成を奪回せよ
同時代社
2005-07
[74]
문서
[75]
웹사이트
古賀達也の洛中洛外日記第520話
http://www.furutasig[...]
2013-02-02
[76]
웹사이트
『古代日本ハイウェーは九州王朝が建設した軍用道路か?』
http://www.furutasig[...]
[77]
서적
古代九州王朝はなかった
新人物往来社
[78]
서적
古墳とヤマト政権
文藝春秋
1999
[79]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80]
서적
新版 魏志倭人伝
講談社
1986
[81]
블로그
聖徳太子をめぐる珍説奇説
https://blog.goo.ne.[...]
[82]
웹사이트
大嘗祭と九州王朝の系図
https://www.furutasi[...]
市民の古代第13集 1991年 市民の古代研究会編
1991-02-0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