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목사는 개신교에서 성직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신약성경에서 유래되었다. '목자'를 뜻하는 헬라어 '포이멘'과 라틴어 '파스토르'에서 영어 단어 '패스터'가 유래되었으며, 한국어 '목사'는 중국에서 유래하여 '목자' 또는 '양치기'라는 뜻을 지닌다. 목사는 예배 집례, 설교, 교육, 봉사, 친교 등 교회의 여러 역할을 담당하며, 교파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과 목사직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개신교 목사는 결혼이 가능하며, 여성 목사 임명 여부는 교파에 따라 다르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목사 - 찰스 스퍼전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며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한 명인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설교가로, 설교와 주석, 어록을 남기고 노예제 폐지 운동과 사회 개혁에 참여했으며 그가 설립한 스펄전 칼리지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많은 신학생이 재학 중인 신학교이다. - 목사 - 데이비드 딕슨
데이비드 딕슨은 스코틀랜드의 칼뱅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로, 글래스고 대학교 철학 교수, 어바인 목사, 글래스고 총회 서기, 글래스고 및 에든버러 대학교 신학 교수를 역임하며 스코틀랜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퍼스 조항 반대 및 언약 운동 참여, 《신앙 고백에 대한 강의》, 《거룩한 치료》 등의 저술 활동을 펼쳤다. - 기독교 성직자 - 월터 스콧
월터 스콧은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로,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스코틀랜드 민속과 전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 소설 장르를 개척하여 19세기 문학계와 스코틀랜드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말년에 재정적 파탄과 아내의 죽음을 겪었다. - 기독교 성직자 - 주교
주교는 기독교에서 교구를 관리하는 최고위 사제로, 각종 성사를 집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교파에 따라 명칭, 의미, 위상이 다르게 해석되는 직책이다. - 표시 이름과 문서 제목이 같은 위키공용분류 - 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표시 이름과 문서 제목이 같은 위키공용분류 - 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2. 유래
서방교회 전통의 개신교에서 성직자를 가리키는 '목사'라는 용어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49]에서 유래했다.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 단어 ποιμήν|포이멘grc은 목자, 즉 양치기를 의미하며,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어인 pastor|파스토르la에서 목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패스터'(pastor)가 유래했다. 성직자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운동 과정에서 개혁에 찬성한 개신교 진영이 자신들의 성직자를 개혁에 반대한 천주교회의 사제와 구별하기 위해 '목사'라는 칭호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어 '목사'(牧師)는 고대 중국에서 백성을 잘 다스린 뛰어난 관리에게 주던 칭호에서 유래했으며, 이 역시 '목자' 또는 '양치기'라는 의미를 지닌 존칭이다.
성경적으로 목사는 양 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과 관련되며, 장로나 감독과 같은 직분과도 연결된다. 목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기준은 2세기부터 논의된 초대 공교회의 직제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13절[52] 등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53][54]
개신교 내 여러 교파에 따라 목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를 수 있다.
2. 1. 어원
서방교회 전통을 지닌 개신교에서 성직자를 가리키는 '목사'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유래했다. 이 명칭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4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약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단어는 ποιμήν|포이멘grc으로, 이는 목자 또는 양치기를 의미한다.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된 pastor|파스토르la에서 목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패스터'(pastor)가 나왔다. 성직자를 칭하는 용어로 예전부터 사용되었지만, 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16세기부터이다. 한편, 한국어 '목사'(牧師)는 고대 중국에서 백성을 잘 다스린 뛰어난 관리에게 주던 칭호에서 유래했으며, 이 역시 '목자' 또는 '양치기'라는 뜻을 지니고 그 자체로 존칭이다.'목사'라는 단어는 '목자'를 의미하는 라틴어 명사 pastorl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목초지로 이끌다, 방목하다, 먹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pascerela에서 파생되었다.[5] '목사'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 즉, 목사, 목자, 장로는 모두 동일한 직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다. 다만, '담임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교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주로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성직자를 '목사'라고 부른다.
오늘날 이 단어의 사용은 양치기에 대한 성경적 비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히브리어 성경 (또는 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רעה|로에he (''roʿeh'')를 사용하는데, 이는 '목자'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양 떼를 돌보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된다.[6]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173번 나타나며(144개의 절에서), 창세기 29장 7절처럼 실제로 양을 먹이는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예레미야서 23:4절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사용된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ro'im'')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그들을 먹일 것(''yir'um'')이라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KJV)

신약성경의 영어 번역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명사 ποιμήν|포이멘grc (''poimēn'')을 '목자'(shepherd)로, 그리스어 동사 ποιμαίνω|포이마이노grc (''poimainō'')를 '먹이다'(to feed)로 번역한다. 이 두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총 29번 등장하며,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다. 성탄절 이야기(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같은 단어들은 문자 그대로의 양치기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다섯 개의 신약성경 구절에서는 이 단어들이 교회의 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 요한복음 21:16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 사도행전 20:17 –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설교를 했으며, 사도행전 20:28에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 고린도전서 9:7 –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에 대해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누가 양 떼를 치고 그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 에베소서 4:11 –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기록했다.
# 베드로전서 5:1-2 –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라"고 권면한다.
여러 교파의 주교들은 그들의 목회적, 즉 양을 치는 기능을 상징하는 양식화된 목자의 지팡이 모양의 공식적인 십자가형 지팡이를 종종 사용한다.
2. 2. 용어 역사
서방교회 전통의 개신교에서 성직자를 가리키는 '목사'라는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유래했다. 이 명칭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49]에서 찾을 수 있다. 신약성경의 원문인 헬라어 단어 ποιμήν|포이멘grc은 목자, 즉 양치기를 의미하며,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어인 pastor|파스토르la에서 목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패스터'(pastor)가 유래했다.[5] '목사'라는 용어는 "목초지로 이끌다, 방목하다, 먹게 하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동사 pascere|파스케레la에서 파생된 명사 pastor|파스토르la에 기원한다.[5]성경에서 '목사'는 장로 및 감독의 역할과 관련 있으며, 이 세 용어(목사, 목자, 장로)는 모두 동일한 직위를 가리킨다. 다만, 여러 교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주로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를 지칭하는 '담임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목사' 또는 '목자'의 개념은 구약성경(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발견된다. 히브리어 단어 רעה|로에he는 명사로 '목자'를, 동사로는 '양 떼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173번 등장한다.[6]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23장 4절에서는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ro'im'')을 세우리니 그들이 그들을 먹일 것(''yir'um'')이요..." 와 같이 두 가지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어 명사 ποιμήν|포이멘grc(목자)과 동사 ποιμαίνω|포이마이노grc(먹이다)가 총 29번 사용되며, 대부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요한복음 10:11 "선한 목자"). 그러나 다섯 곳에서는 교회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 요한복음 21:16: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 사도행전 20:17, 28: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라''고 당부했다.
- 고린도전서 9:7: 사도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을 가리켜 "누가 자기 양 떼를 먹이면서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다.
- 에베소서 4:1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기록했다.
- 베드로전서 5:1-2: 베드로는 독자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그들을 돌보라"고 권면했다.
역사적으로 성직자를 '목사'라고 칭하는 관행은 16세기 서방교회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1세기 교회 대분열로 동방교회와 분리된 로마교회는 서유럽과 북유럽 교회를 통합하며 서방교회를 이루었고, 12세기 이후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를 강화했다.[50]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방교회는 유럽 내 민족 갈등, 정치 권력과의 결탁, 그리고 이로 인한 여러 비리와 왜곡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복음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16세기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다. 이 개혁 운동의 영향으로, 개혁에 찬성한 개신교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성직자를 개혁에 반대한 천주교회의 사제와 구별하기 위해 '목사'라는 칭호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어 '목사'(牧師)라는 단어는 고대 중국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뛰어난 관리에게 주어졌던 칭호에서 유래했으며, 이 역시 '목자' 또는 '양치기'라는 의미를 지닌 존칭이다.
오늘날에도 유럽의 여러 언어에서는 목사와 사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영어권에서는 개신교 목사를 구별하여 '패스터'(Pastor)라고 부르거나, 성직자를 통칭하는 '레버런드'(Reverend)[51]라고도 한다. 여러 교파의 주교들은 목회자로서 양 떼를 돌보는 역할을 상징하는 목자의 지팡이(십자가형 지팡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3. 성경의 근거
"목사"라는 명칭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49]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다.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 ποιμήν|poimēngrc은 목자, 양치기를 의미하며,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어인 pastorla에서 영어 단어 '패스터'(pastor)가 유래했다. 라틴어 pastorla는 "목초지로 이끌다, 방목하다, 먹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 pascerela에서 파생되었다.[5]성경에서 목자의 개념은 구약성경(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히브리어 단어 רעה|roʿehhe는 명사로 "목자", 동사로 "양 떼를 돌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6]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23장 4절에서는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그들을 먹일 것이요..."라고 하여 목자의 역할을 설명한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어 명사 ποιμήν|poimēngrc과 동사 ποιμαίνω|poimainōgrc가 주로 사용되며, 대부분 예수님을 지칭한다.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다.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는 이 '목자'의 개념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된다.
- 요한복음 21장 16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ἐπίσκοπος|episkoposgrc)로 칭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라'(ποιμαίνειν|poimaineingrc)고 권면했다.
- 고린도전서 9장 7절: 바울은 사도들의 권리에 대해 말하며 "누가 자기 양 떼를 먹이면서(ποιμαίνει|poimaineigrc)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 에베소서 4장 11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을 나열하며 "...어떤 사람은 목사(ποιμένας|poimenasgrc)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명시했다. 이 구절은 '목사' 직분의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로 여겨진다.[49]
- 베드로전서 5장 1-2절: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ποιμάνατε|poimanategrc), 그들을 돌보라"고 권면했다.
이처럼 성경에서 '목사'(ποιμήν|poimēngrc)는 '장로'(πρεσβύτερος|presbyterosgrc) 및 '감독'(ἐπίσκοπος|episkoposgrc)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동일시되는 역할로 묘사된다. 성경에서 이 세 용어(목사, 목자, 장로)는 동일한 직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초대 공교회(보편교회) 시기부터 논의된 성직자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13절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오늘날 목사직의 기준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52] 이 본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으로 한 아내의 남편일 것, 절제, 신중함, 술을 즐기지 않음, 다투지 않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림 등을 강조한다.[53][54]
현대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담임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으며, 주로 여러 교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설교와 주요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를 지칭하는 관례적인 표현이다.
3. 역할과 임무
목사는 개신교의 예배와 성례전(세례, 성찬식)을 집례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55] 또한 교회의 전통적인 기본 활동인 선포(케리그마), 예배(레이투르기아), 교육(디다케), 봉사(디아코니아), 친교(코이노니아)를 책임지며,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교회의 5대 역할 수행은 목사의 핵심적인 책임이다.
목사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권한 범위는 감독제, 원로제, 회중제 등 각 교단이 따르는 교회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예배 인도, 설교, 신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목회, 선교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 및 행정 운영 관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25], 신앙 교육과 훈련을 이끄는 교육자의 역할도 맡는다.[25]
3. 1. 목사직의 이해
2세기에 형성된 초대 공교회(보편교회)[52]는 직제를 확립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13절을 통해 목사의 의미와 모습을 정립했다고 본다. 이 본문에서 언급된 성직자인 감독과 집사[53]는 목사의 기준이 된다. 성경은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하며 신중하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다투지 않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며 위엄 있게 자녀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집사 역시 신중하고 믿음을 깊이 이해하며, 절제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54]"목사"라는 단어는 "목자"를 뜻하는 라틴어 명사 pastor|파스토르la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목초지로 이끌다, 방목하다, 먹이다"라는 의미의 동사 pascere|파스케레la에서 파생되었다.[5] 이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장로의 역할과 관련이 깊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즉, 목사, 목자, 장로는 성경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들이다. "담임 목사"라는 용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교역자가 있는 교회에서 주로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는 목사를 "목사(Pastor)"라고 부른다.
오늘날 목사라는 용어의 사용은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성경적 비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히브리어 성경(구약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 רעה|로에he를 사용하는데, 이는 명사로는 "목자"를, 동사로는 "양 떼를 돌보다"를 의미한다.[6]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173번 등장하며, 창세기 29장 7절처럼 실제로 양을 먹이는 행위를 묘사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예레미야서 23:4에서는 "내가 그들 위에 목자들을 세우리니 그들이 그들을 먹일 것이요..."라는 구절에서 명사형(''ro'im'', 목자들)과 동사형(''yir'um'', 먹일 것이다)이 함께 사용된다.
신약성경의 영어 번역본은 보통 그리스어 명사 ποιμήν|포이멘grc을 "목자(shepherd)"로, 동사 ποιμαίνω|포이마이노grc를 "먹이다(to feed)"로 번역한다. 이 단어들은 신약성경에 총 29번 나오며, 대부분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11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칭하셨다. 누가복음 2장의 예수 탄생 이야기 속 목자들은 문자 그대로 양을 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음 다섯 개의 신약성경 구절에서는 이 단어들이 교회의 구성원, 즉 목회자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 요한복음 21:16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 사도행전 20:17, 28 -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먹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고린도전서 9:7 -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에 대해 "누가 자기 양 떼를 먹이면서 그 삯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한다.
- 에베소서 4:11 -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기록했다.
- 베드로전서 5:1-2 - 베드로는 독자들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그들을 돌보라"고 권면한다.
개신교 내에서는 교단 구조에 따라 목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다. 크게 감독제, 원로제, 회중제로 나눌 수 있다.
종교 개혁 시기 장 칼뱅과 울리히 츠빙글리 같은 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의 사제 개념과 차별화하기 위해 성경적인 '목사'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만인제사장설을 강조하며, 목사를 특권적인 성직 계급이 아닌, 회중 가운데 세워진 직무로 이해하려는 의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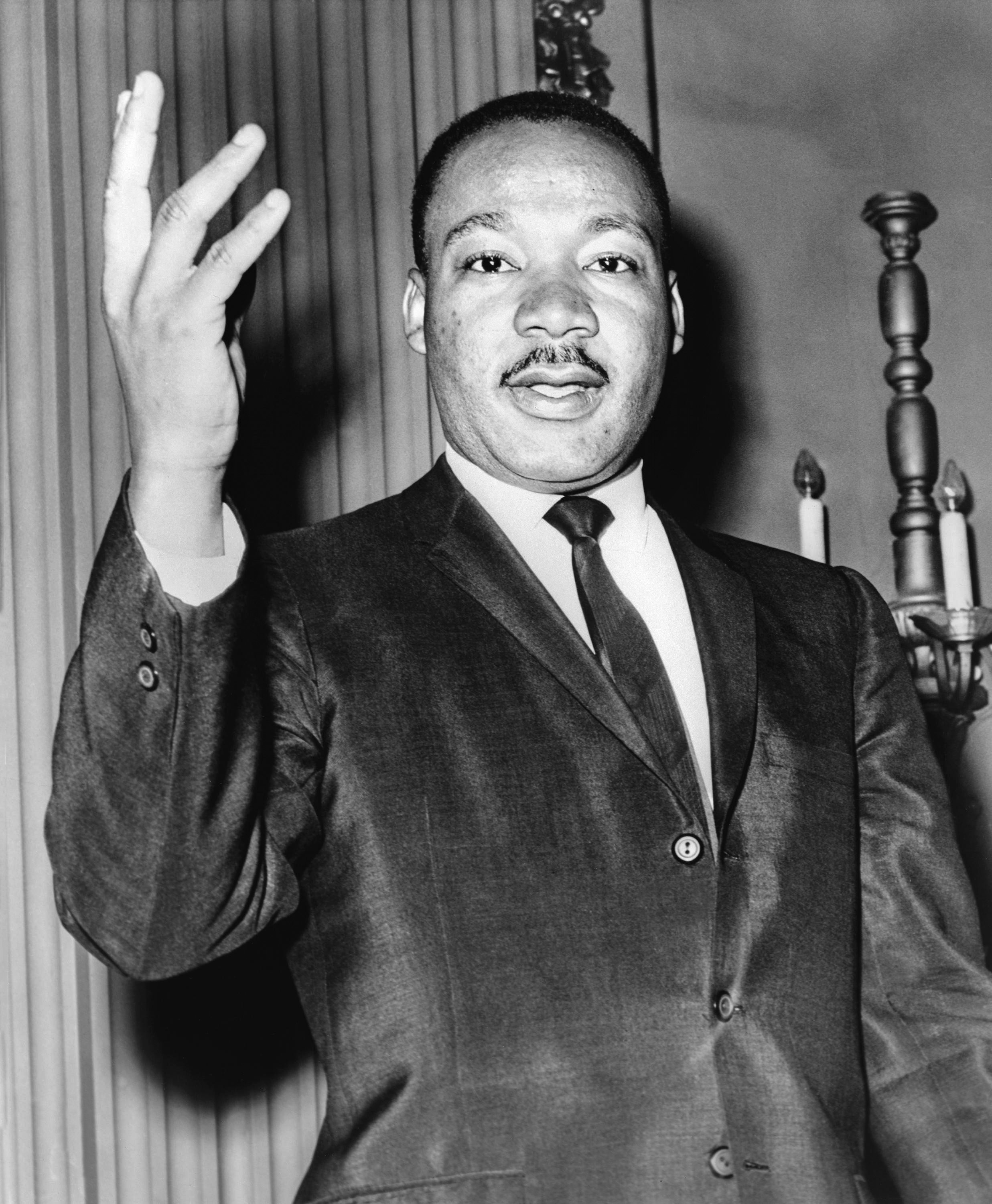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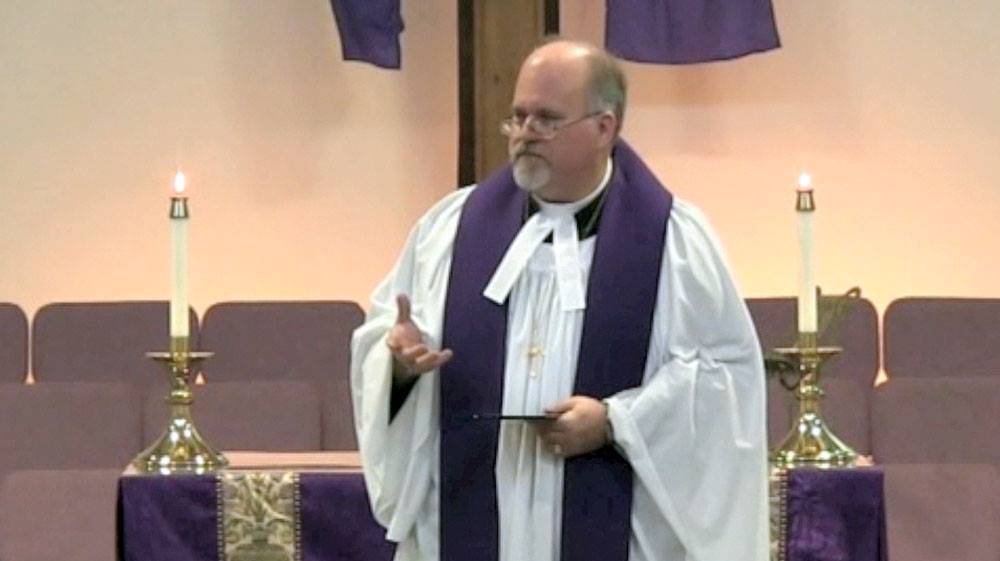
교파별로 목사를 부르는 호칭이나 직제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 가톨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본당 책임자를 '목사(Pastor)'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본당 신부(Parish Priest)'에 해당한다.[8] 교회법상의 공식 용어는 parochus|파로쿠스la이다. 본당 신부는 그에게 맡겨진 본당 공동체의 사목적 돌봄을 교구 주교의 권위 아래 수행하며, 다른 사제나 부제, 신자들과 협력하여 가르침, 성화, 통치의 직무를 법에 따라 수행한다.[9]
- 스웨덴 교회(루터교)는 주교, 사제, 부제의 삼직제를 가지며, 장로 서품을 받은 이를 '사제(Priest)'라고 부른다.[10]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에서는 서품받은 장로를 '목사(Pastor)'[11][12] 또는 '사제(Priest)'[13][14]로 부른다. 미국 루터교 내에서도 교파에 따라 '목사(Pastor)' 또는 '개척 목사(Reverend)'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대부분의 침례교회에서는 '목사(Pastor)'를 교회 내 두 가지 직책(다른 하나는 집사) 중 하나로 보며, '장로(Elder)' 또는 '감독(Bishop/Overseer)'과 동의어로 간주한다.[15][16] (단, 개혁 침례교에서는 장로를 별도 직책으로 보기도 한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설교를 주로 담당하는 '담임 목사(Senior Pastor)' 외에 특정 사역을 담당하는 '찬양 목사' 등 다양한 직함을 사용하기도 한다.[17]
- 성공회에서는 안수받은 장로를 '사제(Priest)'라고 부르며, 낮은 교회 성향에서는 "목사(the Reverend)", 높은 교회 성향에서는 "신부(Father)" 또는 "수녀(Mother)"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한다.[18] 안수받지 않았으나 허가받은 평신도 지도자에게 '목사(Pastor)' 칭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연합감리교회는 부제와 장로 직분을 안수하며, 두 직분 모두 상황에 따라 '목사(Pastor)'로 불릴 수 있다. 또한, 설교 면허를 받아 임명된 비안수 성직자(준회원 목사 또는 설교 면허를 가진 지역 목사)도 '목사'로 칭한다. 이러한 목사들은 평신도, 신학생 또는 안수 과정을 밟고 있는 신학대학원 졸업생일 수 있으며, 임명된 담당 구역 밖에서는 성직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19]
현대 개신교에서 목사는 일반적으로 예배 인도, 설교, 성례 집행(세례와 성찬), 신자들을 돌보는 목회, 선교 및 교회 행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25] 교회 내에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25]
개신교에서는 만인제사장설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를 다른 신자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성직자'로 부르기보다는, 동등한 신자 중에서 특정 직무를 맡은 '교직자' 또는 '교역자'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목사직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여러 명의 목회자가 함께 사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책임자를 '주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다른 목회자를 '부목사' 또는 '협동 목사'로 부르기도 한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며, 목회 훈련 과정에 있거나 특정 사역(병원 방문, 봉사 활동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목사'라는 별도의 직제나 안수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학적으로는 주임 목사나 부목사 모두 동등한 '목사'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부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일본 기독교단과 같이 일부 교단에서는 성례 집행 자격 유무에 따라 교직을 구분하여, 자격이 없는 교직자를 전도사(보교사)로 구별하기도 한다.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순회 설교자, 미션 스쿨의 성경 교사, 은퇴한 목사 등은 안수례를 받고 목사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엄밀하게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아닐 수 있다.
3. 2. 목사의 구체적인 임무
개신교의 예배와 성례전(세례, 성찬식) 집례는 목사의 기본적인 임무이다.[55] 또한 교회 공동체의 전통적인 기본 활동인 케리그마(κηρυγμα|케리그마grc, 선포),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레이투르기아grc, 예배), 디다케(Διδαχή|디다케grc, 교육),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디아코니아grc, 봉사),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코이노니아grc, 친교)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다섯 가지는 흔히 교회의 5대 역할로 불린다.모든 교파의 개신교 목사는 이러한 보편적 교회의 활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지도해야 하는 기본적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 케리그마 (선포): 설교와 권면을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 레이투르기아 (예배): 예전에 따른 예배를 인도하고, 세례(침례)와 성만찬 집전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올바르게 실천한다.
- 디다케 (교육):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며, 기도를 실천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고 심방한다.
- 디아코니아 (봉사): 이웃의 필요에 따라 섬김을 실천한다.
- 코이노니아 (친교): 영적 교제를 통해 이웃과 교인에게 사명을 나누고 함께 하도록 이끈다.
목사는 교인들과의 목회적 상담이나 신앙 상담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적 돌봄 개념에 해당한다.
400년경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목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혼란을 일으키는 자는 꾸짖고, 낙담한 자는 격려하며, 허약한 자는 지지하고, 반대하는 자는 논박하고, 배신자는 경계하며, 기술 없는 자는 가르치고, 게으른 자는 깨우치고, 다투는 자는 제지하고, 거만한 자는 억누르고, 소송하는 자는 진정시키고, 가난한 자는 구제하며, 억압받는 자는 해방시키고, 선한 자는 칭찬하며, 악한 자는 참아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7]
이 외에도 목사는 선교 활동, 교회의 사무 관리 및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25], 신앙 지도와 훈련을 실천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중요하다.[25]
일반적으로 목사는 안수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예배 인도, 설교, 성례 집행, 신도 목회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순회 설교자, 미션 스쿨의 성서 교사, 은퇴 목사 등은 안수례를 받고 목사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특정 교회의 목회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목사로 보기는 어렵다.
개신교 내에서는 교단 구조(예: 감독제, 원로제, 회중제)에 따라 목사의 역할과 직분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앞서 언급된 5대 역할 수행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는 모든 교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4. 목사의 결혼
기독교 초기에는 성직자의 결혼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파별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동방 가톨릭 교회 제외)의 사제는 원칙적으로 독신이지만, 개신교 목사는 결혼할 수 있다. 이는 종교개혁 시기 서방교회의 성직자 독신주의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비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신교는 오히려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등을 근거로 목사의 결혼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35]
동방 정교회의 경우, 성품성사를 받기 전이라면 결혼할 수 있어 가정을 가진 사제도 존재하지만, 주교는 독신을 선언한 수도사 중에서 선출되므로 결혼하지 않는다.
4. 1. 기독교 초기의 성직자 결혼
기독교 초기부터 성직자의 결혼은 당연한 일이었다. 313년 교회가 공인되기 이전에도 성직자들은 결혼했으며, 예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역시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 교부들 중 독신 생활을 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실제로 많은 교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다.공교회(보편교회) 시기에도 성직자의 결혼에는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감독이나 주교직은 독신을 서약한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맡는 경우가 늘어났고, 점차 이 직책은 독신 성직자들이 맡게 되었다. 현재 동방정교회에서는 사제의 결혼이 허용되지만, 주교직은 여전히 독신을 서약한 수도사들이 맡고 있다.
4. 2. 서방교회의 결혼 금지
11세기 교회 대분열이 일어나 보편교회에서 서방교회가 분리되면서, 기독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서방교회에서는 교황직의 승계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2세기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게 되었다.그러나 결혼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혼과 연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었다. 서방교회의 많은 성직자들은 약혼을 하거나 연인과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심지어 교황의 결혼과 밀회도 지속되었다[56]. 16세기까지는 성씨를 물려주는 결혼만 금지되었으나, 일부 교황들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서방교회가 현재의 개신교와 천주교로 분리되자, 천주교 측에서는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결혼뿐만 아니라 약혼까지도 금지하며 규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4. 3. 개신교회 성직자 결혼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로서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한다. 이는 '신학적인 측면'과 '생활윤리적인 측면' 모두에서 천주교회의 성직자 독신주의를 비판하고 개혁한 결과이다.역사적으로 서방교회는 11세기 교회 대분열 이후 교황직의 세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2세기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50]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제들이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약혼녀나 연인과 함께 살며 자녀를 낳는 등 사실상의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교황들 역시 밀회를 통해 자녀를 두는 경우가 있었다.[56] 이러한 상황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주요 비판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개혁 찬성파였던 개신교는 이러한 위선적인 상황과 더불어 일부 사제들의 초혼권 주장, 수도원의 윤리적 타락[58] 등을 문제 삼았다.[57]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보았다. 종교개혁 이후 천주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사제의 결혼은 물론 약혼까지 금지하며 독신주의를 더욱 강화했다.
신학적으로 개신교는 교황 제도 자체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결혼 금지 역시 성경에 위배된다고 본다. 특히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2절("감독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과 12절("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근거로 성직자의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라테란 공의회의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고 보는 핵심 이유이다. 천주교회가 독신제의 근거로 제시하는 고린도전서 7장의 경우, 바울로 사도가 독신 생활의 유익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권면이지 모든 성직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명령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개신교에서는 만인 제사장설에 따라 목사를 성직자라는 특별한 계급으로 보기보다는 교회의 직분자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사제와 같은 엄격한 독신주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목사도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은 창조의 질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며[35], 목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 관계나 자녀 양육을 경험하는 것이 교인들의 삶의 문제에 공감하고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신학교에서는 목사 후보생이 기혼자일 것을 선호하거나 독신자의 입학을 제한하기도 한다. 다만, 목회자가 자발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독신 서원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개신교의 이러한 입장은 성품성사를 받기 전에는 결혼이 허용되는 정교회와 일부 유사하다. 그러나 정교회에서는 주교의 경우 독신 서원을 한 수도사 중에서 선출되므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5. 목사 안수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 대부분에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약 10년이 넘는 기간의 전문 교육과 목회 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각 교단이 정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학부 과정에서 신학을 전공했더라도 필요한 총 기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교단에서는 특정 연령 요건을 두기도 하며, 자격을 갖추었으나 나이가 어린 경우 전도사로 먼저 활동하다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한다.
5. 1. 대한민국 목사 안수 과정
대한민국의 대부분 개신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후 교단별 수련 과정을 거치는 등 약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한 경우에도 총 기간은 비슷하다. 일부 교단에서는 만 30세 이전에 안수 자격을 갖춘 경우,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해당 연령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한다.'''기독교대한감리회'''[59]
감리교회는 목사를 성직 자격으로 간주하는 공교회 전통을 따른다. 감리교단 인준 신학대학원 졸업 후 '수련목회자'(수련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후 총 3년(서리 과정 1년, 수련 과정 2년) 동안 소속 교회에서 교단 감독 하에 수련을 거친 뒤, 소속된 연회의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회는 1930년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성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목사 안수를 시행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 '''수련목회자 자격조건''': 감리교회 교인으로 4년제 대학 졸업 후 감리교단 인준 신학대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 졸업 및 소속 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이 필요하다.
- '''수련 과정''': 총 3년간 4차례의 시험과 과제, 훈련, 담임목사 및 지방/연회 평가를 거친다.
- '''1차 고시''':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 신학, 교회 역사 필기시험 및 면접. 합격자는 '수련목' 신분으로 교단의 지원을 받으며 수련하며, 이 기간 동안 전도사로 불린다. 매년 교단 과제 및 훈련, 소속 교회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2차 (제1년) 서리 과정''': 성직 예비자 과정. 필기시험(성서신학, 기독교윤리, 목회신학, 신구약성경)과 건강진단(신체/정신)을 받는다. 소속 교회 담임목사의 평가(신학 독서 보고서, 목회 활동 전반)를 받고, 교단 영성 훈련 참여 및 과제 수행, 지방 감리사 주관 성직심사 통과, 목회 주제 소논문 합격, 연회 1차 성직심사(다면 면접) 통과 후 감리교 준회원이 된다.
- '''3차 (제2년) 준회원1 과정''': 필기시험(교회교육, 역사신학, 예배학, 신구약성경)을 치른다. 소속 교회 담임목사 평가, 교단 영성훈련 및 프로그램 이수, 설교 관련 소논문 합격, 연회 2차 성직심사(다면 면접) 통과가 필요하다.
- '''4차 (제3년) 준회원2, 성직준비 과정''': 성직 안수 준비 과정. 필기시험(교회행정, 목회신학, 조직신학, 신구약성경)을 본다. 소속 교회 담임목사 평가, 교단 영성훈련 및 프로그램 이수, 교회행정 관련 소논문 통과, 연회 3차 성직심사(다면 면접)를 마쳐야 한다. 안수 직전 다시 건강진단(신체/정신)을 받는다. 이후 안수 대상자 기본교육 및 영성훈련을 거쳐 연회 성직위원회의 최종 심사(병원 정신과 검사 포함) 후, 연회에서 감독이 안수한다.
- '''허입불가 사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신체/정신적 이상, 과중한 채무, 도박, 마약, 부도덕한 생활,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리 과정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존 웨슬리 및 알미니안 신학에 기반하여 사중복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양성한다.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 신학대학원(M.Div) 졸업 후, 4년간의 목회 교육(단독 목회 시 2년)을 이수하고 목사고시, 전도사 교육(총 3회), 지방회 및 총회 면접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는다. 또한 사역하는 교회 내 당회나 직원회의 인준을 거쳐 흠이 없어야 최종적으로 안수받을 수 있다.
'''장로교'''[62]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해당 교단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외)에서는 목사고시 응시 전, '강도사' 또는 '준목' 고시에 합격하여 1년 이상 목회 경력을 쌓아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다. 강도사/준목 제도가 없는 교단은 별도의 자격 조건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교단의 신앙고백서, 신학, 교단 헌법 등에 대한 시험과 면접을 거쳐 노회에서 안수하여 목사를 세운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교회에서 추천받아 교단 인준 신학교육(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이수한 목회자 후보생(전도사)이 소속 교회에서 3년 이상 수련 과정을 거친다. 이후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추천 및 인준을 받아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구원 간증,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 성장학/선교학 등 다방면에 걸쳐 구술 및 필기시험으로 평가한다. 기준 미달 시 재검증 기회를 가지며,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원 합의로 합격하면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시취 위원 목사들이 함께 안수식을 거행한다.
목사 후보자는 신앙 및 인격에 결격 사유가 없고, 소정의 신학 과정 이수, 기혼자(선교사, 군목 등 예외 인정)여야 하며, 하나님과 성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침례교 목사는 장로교와 달리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겸하는 독특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며, 말씀 전파, 성도 돌봄, 성례 집례 등을 담당한다.
5. 2. 다른 나라의 목사 안수 과정
목사직의 안수 방식은 정부와의 관련 여부, 즉 해당 국가가 국교나 왕실종교를 채택했는지, 종교 세금과 연계되어 있는지, 혹은 종교 자유주의를 채택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정부와 관련된 국가의 경우, 유럽에서 개신교를 국교 또는 왕실종교로 정한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랜드, 덴마크, 노르웨이[63], 스위스 일부 지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이 있다. 국교나 왕실종교는 아니지만, 정부가 종교 세금을 징수하여 준국가기관 지위를 갖는 독일의 개신교회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의 국교회 소속 목사는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석사 학력에 해당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교회가 정한 과목과 연수 과정을 마친 뒤 목사로서의 자격, 즉 안수를 받게 된다. 안수받은 목사는 지역 교구 목사로 파송되어 담임 목사나 보좌 목사로 활동하며, 대체로 출신 지역의 대교구로 배정받는다. 목사를 육성하고 선발하여 안수하는 과정은 국가별 교육 제도나 신학교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루터교회를 국교회나 왕실종교로 정한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에서는 신학교 졸업 후 목사 자격 시험을 치른다. 독일 개신교 목사도 이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는데, 신학 분야와 언어 분야(라틴어, 코이네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과 교회사, 기독교 사상, 기독교윤리, 성서 등의 분야별 시험을 통과해야 목사 수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련 과정을 마치면 해당 지역 감독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이러한 국가에도 국교회 이외의 교회(비국교회)가 존재하며,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목사의 법적 자격이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를 채택한 지역에서는 해당 교단의 관리 하에 전통적인 절차와 훈련을 따라 목사를 안수한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자유주의 국가 중 미국에서는 각 개신교회 교단의 3년 과정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이 정한 훈련 과정과 목사 자격 시험을 거치며, 목회 훈련을 받아야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시험은 주요 신학 분야인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와 성서 시험 등을 포함한다. 교단의 성격에 따라 훈련 기간과 시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각 교단은 자체적인 과정을 통해 목사를 양성하고 안수한다.
교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교파가 지정한 신학교에 다니며 성경, 신학,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아람어, 콥트어, 상담, 교회 음악 등을 배운다. 신학교는 공인된 대학의 신학부나 전문학교, 각종학교일 수도 있고, 공립 학교 제도 밖에 있는 교단의 학교(종교법인립이나 사숙 등)일 수도 있다. 졸업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전도사가 된다. 일부 교파는 바로 목사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담임 목사가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서 경험을 쌓는다.
또한, 일부 중화 계, 아프리카 계, 그리고 미국의 교회에서는 신학교 제도에 반대하여, 사제 제도나 소속 교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학 교육 과정을 이용하여 교역자를 훈련하기도 한다.
6. 대한민국의 목사
대한민국의 개신교 목사들은 근현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세기 말 선교 초기부터 교육 및 의료 활동에 참여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광복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 등 다양한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64] 그러나 일부 목사들은 신사참배에 동조하는 등 친일 행적을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64]
6. 1. 근현대사에서의 목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특히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 이후 목사들은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했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고 해외에 독립운동 소식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64] 광복 이후에는 문익환 목사(장로교) 등이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며, 나아가 민족 통일을 위한 운동에도 힘썼다. 이처럼 목사들은 광복, 노동 인권, 민주화, 민족 화해 및 통일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했다.[64] 그러나 일부 목사들은 신사참배 강요에 동조하는 등 친일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에 대해 한경직 목사가 1992년 처음으로 공개적인 회개를 하기도 했다.[64]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감리교의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조약 무효 운동이 시작되었다. 김구와 이준 선생 등이 전덕기 목사와 함께 활동했으며, 전덕기 목사가 담임하던 상동감리교회에서는 1907년 교인들과 함께 성금을 모아 헤이그 특사 파견을 지원했다.[65] 같은 해 상동감리교회에서는 신민회가 창설되어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재 선생 또한 전덕기 목사와 교류하며 신분을 넘어선 평등한 관계를 실천했다. 이상재는 양반 출신이었고, 전덕기 목사는 중인 출신의 노동계층이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사귐을 나누었다.[65] 전덕기 목사는 1912년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체포되었고, 심한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났다.[66]
1910년 1백만 구령운동을 제창했던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는 국권 상실로 인한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고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그 역시 1912년 105인 사건으로 다른 애국지사들과 함께 수난을 겪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3·1 운동의 핵심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다. 이 중 13명이 감리교와 장로교 소속 목사였고, 3명은 신도였다. 이들 16명 가운데 고령으로 안질환이 있던 한 명[67]과 중국으로 망명한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 특히 섬유 등 경공업 분야의 여성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자,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68]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제공하고 야학을 운영하며 노동자 스스로 인권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왔다.[69]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감리교회 신자였다.
문익환 목사는 구약성서 이야기를 바탕으로 《히브리민중사》를 저술하여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억압받는 민중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행동하도록 격려했다. 그는 또한 부당한 권력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민중에게 순종만을 강요하는 당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다.
6. 2.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개신교 목사들은 대한제국 시기 의료와 교육 선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광복 이후에는 고 문익환 목사 등이 참여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운동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목사가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목사들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등 친일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친일 행적을 보였던 목사 중 한 명인 한경직 목사가 1992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다.[64]7. 목사의 종류 (호칭)
개신교 교회 목사에 대한 정의는 교파에 따라 다르므로, 개신교 전체 교파에 공통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예배, 설교, 목회, 선교, 그 외 교회의 사무적인 관리 운영 등을 직무로 한다.[25] 또한 교회에서 신앙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25]
엄밀하게 정의하면 "목사"는 안수례를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신도를 목회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안수례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순회 설교자, 미션 스쿨의 성서 교사, 은퇴한 목사 등은 안수례를 받고 목사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재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와는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될 수 있으나, 명칭과 역할은 교단별로 차이가 있다.
- '''순회목사''': 일정한 교회를 맡지 않고 여러 교회의 요청에 따라 설교하거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관리하는 목사이다.[70]
- '''담임목사''':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여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목사이다. 감리교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감독이 파송하며, 시무 교회가 있는 해당 구역에 소속된다.
- '''부목사''':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맡은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이다. 장로교에서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연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가 사임하면 함께 사임한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여러 교직자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임목사 외의 목사를 부목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부목사도 동등한 목사라는 이해에서 '부목사'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교회도 있다.
- '''군종목사''': 군부대 내에서 사역하는 개신교 목사로, 군종장교 중 가장 수가 많다.
- '''무임목사''': 장로교 제도로, 시무지가 없거나 노회의 허락 없이 활동하는 목사를 의미한다.
- '''원로목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만 70세 정년으로 은퇴하는 목사에게 교회가 예우 차원에서 추대하는 명예직이다.
- '''위임목사''': 장로교 제도로, 노회에 소속되어 노회의 위임을 받아 위임식을 거친 목사이다. 만 70세 정년까지 신임 투표 없이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종신목사이다.
- '''임시목사''': 장로교 제도로, 위임받지 않은 목사이며 이론상으로는 몇 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신임을 얻어야 연임할 수 있다. (참석인 2/3 이상 찬성 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신임 투표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파송목사''': 노회의 허락을 받아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
- '''기관목사''': 신학교, 병원, 학교 등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목사이다.
일본 기독교단과 같은 일부 교단에서는 성례 집행 자격이 없는 교직(보교사)을 두어 전도사라고 구별하기도 한다.[26]
개신교에서는 목사를 성직자로 부르기보다는 교역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목사직의 성성(거룩함)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 사상을 강조하여 목사 개인을 회중과 구별하는 호칭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교파별 교역자의 호칭과 직책을 비교한 것이다. 사제와 목사는 위상과 개념이 다르며, 다른 언어에서도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 영어에서 목사는 Pastor, 사제는 Priest)
8. 다른 종교와의 비교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 목사"와 같이 회중의 안수를 받은 지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목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20][21]
개신교 교회 목사에 대한 정의는 교파에 따라 다르므로, 개신교 전체 교파에 공통되는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다음 설명은 일반적인 개요이다.
다음 표는 기독교 교파별로 다른 교역자의 호칭을 비교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제(Priest)와 목사(Pastor)는 위상과 이해가 다르며, 다른 언어에서도 다른 명칭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목사는 "Pastor영어"이고, 사제는 "Priest영어"이다. Pastor에 해당하는 역할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주임 사제가 맡는다는 점에서도, 두 직책이 동일하게 간주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영어 단어라도 교파별로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 "deacon영어"은 동방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부제로, 성공회에서는 집사로 번역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주임사제가, 동방 정교회에서는 관할 사제가 특정 교회의 목회(종교적 지도)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개신교 목사가 담당하는 역할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동방 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성공회에서는 이들을 성직자라고 부르는 반면, 개신교에서는 교역자 또는 교직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9. 여성 목사
개신교에서 목사에 대한 정의는 교파마다 다르므로, 모든 교파에 통용되는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여성 목사에 대한 입장 역시 교파별로 차이가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아직 여성 사제가 없지만, 개신교의 일부 교파에서는 여성 목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개신교의 경우, 일본기독교회의 토미타 미쓰루의 동의를 얻어 1933년 12월 5일에 안수받은 다카하시 히사노가 여성 목사의 시초로 여겨진다. 이듬해인 1934년에는 우에무라 마사히사의 딸인 우에무라 타마키가 안수를 받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이른 시기의 여성 목사 사례 중 하나이다.[36] 이러한 초기 여성 목사의 존재는 이후 일본 개신교 내에서 여성 목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는다. 일본기독교단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도 다수의 여성 목사를 채용하여 교회에서 설교하도록 했으며, 주의 십자가 크리스천 센터 역시 여성 목사가 많은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다.[37] 반면, 미노 미션 소속 선교사였던 세디 리 와이드너는 여성 목사가 비성경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스스로 목사가 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찰스 스펄전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도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으로 남아 있으며, 마틴 로이드존스나 남부 침례교 연맹, 일본 침례교 연합 등 일부 교단 및 인물들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38][39][40] 하지만 구세군과 같이 설립 초기부터 여성 목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교단 대표로 임명하는 등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교파도 존재한다.
일본 성공회의 일부 주교들은 '성공회의 신앙과 직제를 생각하는 모임'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주교를 남성 중에서 선발하고 사제직을 남성에게 한정하는 전통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41]
정교회에서는 여성이 신품 (정교회의 성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여성 전도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42] 다만 현재 일본정교회에는 여성 전도사가 없다. 근현대에 들어 정교회 내에서 과거 여성 부제가 존재했으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직전에 열린 러시아 정교회 공회 준비 과정에서 여성 부제 제도 부활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나, 혁명 이후 공산주의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다른 개혁안들과 함께 무산되었다.[43] 한편, 동방 정교회 일부(특히 그리스)에는 고대부터 '여 부제'라는 직분이 존재했지만, 이는 남성 부제와 유사한 역할을 일부 수행했을 뿐, 기본적인 역할과 지위는 다르다고 여겨진다.
참조
[1]
서적
40 Questions about Elders and Deacons
https://books.google[...]
Kregel Academic
2024-02-24
[2]
서적
World Christian Trends, AD 30-AD 2200: Interpreting the Annual Christian Megacensus
https://books.google[...]
William Carey Library
2024-02-24
[3]
서적
Encyclopedia of Protestantism
https://books.google[...]
Infobase Publishing
2024-02-24
[4]
웹사이트
pastor Definition of pastor
https://web.archive.[...]
2018-06-10
[5]
웹사이트
pastor
http://www.etymonlin[...]
2018-06-10
[6]
웹사이트
Genesis 1:1 (KJV)
https://www.bluelett[...]
2018-06-10
[7]
서적
Sermon CCIX, cited in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Practical Theology
John Wiley & Sons
2011-12-27
[8]
웹사이트
Why are some Catholic priests called "pastor"?
https://aleteia.org/[...]
2021-04-25
[9]
웹사이트
Code of Canon Law: text - IntraText CT
http://www.intratext[...]
2024-02-24
[10]
웹사이트
Ministry and Ministries
https://www.svenskak[...]
2024-02-02
[11]
웹사이트
Parishes
https://evl.fi/en/th[...]
[12]
웹사이트
Women ordained for thirty years
https://evl.fi/en/cu[...]
[13]
뉴스
Gallery: Turku makes history with first female bishop
https://www.helsinki[...]
2021-02-08
[14]
서적
Law and Religion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08-04
[15]
웹사이트
Two Church Officers: Pastors and Deacons
https://www.baptistd[...]
Baptist Distinctives
2010-00-00
[16]
서적
The Encyclopedia of Christianity, Volume 4
Wm. B. Eerdmans Publishing
[17]
서적
Worship Quest: An Exploration of Worship Leadership
Wipf and Stock Publishers
[18]
서적
An Anglican-Methodist Covenant: Common Statement of the Formal Conversations Between the Methodist Church of Great Britain and the Church of England
Church House Publishing
[19]
웹사이트
Ministry of Local Pastors
http://www.bomlibrar[...]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
뉴스
Buddhist Pastors Around The World
http://www.tsemrinpo[...]
2017-02-08
[21]
웹사이트
I am a Pastor now… A Buddhist one There's No Way But Up
http://www.davidlai.[...]
[22]
웹사이트
wikt:en:pastor#English
https://en.wiktionar[...]
[23]
웹사이트
wikt:en:Pastor#German
https://en.wiktionar[...]
[24]
웹사이트
wikt:en:pastor#Latin
https://en.wiktionar[...]
[25]
서적
キリスト教教育事典
日本キリスト教団出版局
[26]
웹사이트
教規 -第5章- - 日本基督教団公式サイト
http://uccj.org/rule[...]
[27]
웹사이트
성공회, 성직자, 호칭, 복장, 교회 성장(聖公会、聖職者、呼称、服、教会成長)
https://skhfaq.wordp[...]
성공회 질문 답변(聖公会質問回答)
2001-01-21
[28]
간행물
宗教指導者の「老後」 : 現代日本のキリスト教界を中心に
http://id.nii.ac.jp/[...]
鈴鹿国際大学
[29]
웹사이트
Etiquette and Protocol
http://www.goarch.or[...]
Greek Orthodox Archdiocese of America
[30]
웹사이트
主任司祭からのメッセージ
http://www.catakanaw[...]
カトリック高輪教会
2019-04-00
[31]
웹사이트
Clergy & Staff
https://www.saintaid[...]
St. Aidan's Episcopal Church
[32]
웹사이트
信徒の働きを生かす英国の教会
http://www.nskk.org/[...]
日本聖公会 管区事務所
2003-11-05
[33]
웹사이트
一つの修女会の発展的解消
https://nskk-chubu.o[...]
日本聖公会 中部教区
2014-07-01
[34]
뉴스
26日に引退する「初の女性司祭」閔丙玉神父
https://www.seoul.co[...]
ソウル新聞
2011-04-13
[35]
서적
牧師の仕事
教文館
[36]
서적
여성교직의 역사
일본기독교단출판국
[37]
웹사이트
주의 십자가 크리스찬 센터는 여성이 사용되는 교회입니다
http://tokyo0.antioc[...]
2021-06
[38]
서적
목회입문
생명의말씀사
[39]
서적
설교와 설교자
생명의말씀사
[40]
서적
영광에 충만한 기쁨
지인망출판
[41]
웹사이트
성 마테야일 성명 일본성공회 ‘성공회의 신앙과 직제를 생각하는 모임’
http://fellows.frees[...]
[42]
웹사이트
ORTHODOX CHRISTIAN MISSION CENTER NEWS LISTSERVER
http://www.ocmc.org/[...]
[43]
서적
신앙의 신비
도쿄 부활 대성당 교회
2004
[44]
웹사이트
성직자 프로필
http://www.st-andrew[...]
성 앤드류 교회
2021-09-21
[45]
웹사이트
림간 성 바르나바 교회
http://rinkan-barnab[...]
2021-09-21
[46]
서적
나카다 주지 전
[47]
문서
3.1 독립선언 당시 목회가 아니라 기독교 관련 기관에 소속된 이들이 있었음.
[48]
백과사전
목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9]
성경
성경전서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50]
서적
그리스도교
분도출판사
2002
[51]
문서
약식 표기 'Rev.', 'Rev'는 기독교 공동체의 성직자를 '성스러운 직분'이라는 의미의 경칭으로 영어권에서 모든 기독교계 성직자를 칭한다
[52]
문서
헬라어, '에클레시아 카톨리케'( ἐκκλησιακαθολικη)로 모든 교회가 연합한 전체인 하나의 교회를 뜻함. 11세기 이전의 하나였던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며 현재의 정교회, 천주교회, 개신교회의 공통적 전통이 되는 교회를 의미함.
[53]
성경
성경전서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54]
성경
성경전서 새번역 디모데전서 3장 2-7절, 3장 8-13절 본문 요약
대한성서공회
[55]
문서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예수교 대한 장로회-통합과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는 성례전을 위한 예식서를 사용하고 있다.
[56]
서적
풍속의 역사2: 르네상스
까치글방
2001
[57]
서적
교회사2
분도출판사
2007
[58]
서적
풍속의 역사 2: 르네상스 (개역판)
까치글방
2001
[59]
서적
교리와 장정
기독교대한감리회
2007
[60]
문서
감리교회에서 30개 정도의 교회가 모인 연회의 하부 지역으로 감리사 관할한다.
[61]
문서
감리교회의 감독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매년 열리는 회의로 교회행정결정과 목사 안수 등의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62]
문서
한국의 장로교는 단일 교단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교단으로 한국 장로교를 이루고 있다. 이중 기장, 고신, 통합, 합동이 오래된 장로교단이나 조금씩 다른 목사 안수 제도를 가지고 있다.
[63]
문서
노르웨이에서 루터교가 국교였으나 2017년 국교가 폐지되었다. 현재는 노르웨이의 왕실 종교로서 국가 종교세금과 관련된다.
[64]
웹사이트
http://m.kmib.co.kr/[...]
[65]
서적
기독교 사회주의 산책, 새로운 역사를 향한 우리의 성서 읽기
http://www.yes24.com[...]
홍성사
2011-08-31
[66]
백과사전
전덕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67]
문서
체포되어 1년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이후에 무죄로 풀려났다.
[68]
뉴스
한국 산업 선교, 노동운동 씨 뿌린 조지송 목사…"노동문제는 교회 선교 문제이자 국가 문제라고 인식"
https://www.newsnjoy[...]
뉴스엔조이
2022-01-22
[69]
서적
교실 밖 국사여행(개정판) ,공순이, 노동자로 거듭나다 ┃ 1970년대 여성 노동자
http://www.kyobobook[...]
사계절출판사
2016-03-28
[70]
웹사이트
순회목사
https://ko.wikisourc[...]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