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 (수학)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체는 덧셈과 곱셈 연산이 정의된 대수적 구조로, 가환환이면서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갖는 나눗셈환이다. 체는 다항 방정식의 해법, 대수적 수론, 대수 기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는 표수, 소체, 초월 차수와 같은 불변량에 따라 분류되며, 유리수, 실수, 복소수, 유한체 등이 있다. 체는 선형대수학, 암호학, 부호 이론, 기하학, 수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체론 - 분해체
분해체는 체 K 위의 다항식 p(X)가 일차 인자의 곱으로 완전 인수분해되고 그 근들에 의해 K 위에서 생성되는 체 확대 L을 의미하며, 동형을 제외하고 유일하고 갈루아 군과 관련이 있다. - 체론 - 대수학의 기본 정리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모든 비상수 복소 다항식이 복소수를 근으로 갖는다는 정리이며, 복소수체의 대수적 폐포를 정의하고 다항식의 근의 개수와 표현, 실계수 다항식의 인수분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정의
체는 덧셈과 곱셈이라는 두 이항 연산이 정의된 집합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만족한다.
- 결합 법칙: 덧셈과 곱셈 모두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즉, 체 ''F''의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해,
- 덧셈: (''a'' + ''b'') + ''c'' = ''a'' + (''b'' + ''c'')
- 곱셈: (''a'' ⋅ ''b'') ⋅ ''c'' = ''a'' ⋅ (''b'' ⋅ ''c'')
- 교환 법칙: 덧셈과 곱셈 모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즉, 체 ''F''의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
- 덧셈: ''a'' + ''b'' = ''b'' + ''a''
- 곱셈: ''a'' ⋅ ''b'' = ''b'' ⋅ ''a''
- 항등원: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각각 존재한다. 즉, 체 ''F''에는 다음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원소 0과 1이 존재한다.
- 덧셈 항등원(0): 임의의 ''a'' ∈ ''F''에 대해, ''a'' + 0 = ''a''
- 곱셈 항등원(1): 임의의 ''a'' ∈ ''F''에 대해, ''a'' ⋅ 1 = ''a''
- 역원: 0을 제외한 모든 원소에 대해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즉,
- 덧셈 역원: 임의의 ''a'' ∈ ''F''에 대해, ''a'' + (−''a'') = 0을 만족하는 −''a'' ∈ ''F''가 존재한다.
- 곱셈 역원: 임의의 0이 아닌 ''a'' ∈ ''F''에 대해, ''a'' ⋅ ''a''−1 = 1을 만족하는 ''a''−1 ∈ ''F''가 존재한다.
- 분배 법칙: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즉, 체 ''F''의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해, ''a'' ⋅ (''b'' + ''c'') = (''a'' ⋅ ''b'') + (''a'' ⋅ ''c'')
이러한 성질들을 만족하는 체는 유리수, 실수 등과 같이 익숙한 수 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의 개념은 대수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반이 된다.
2. 1. Classic definition (고전적 정의)
'''체'''는 덧셈과 곱셈이라고 불리는 두 이항 연산이 정의된 대수적 구조이다. 체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가환환 으로 정의할 수 있다.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체는 모든 0이 아닌 원소가 곱셈에 대해 가역원인 가환환이다.
체의 준동형은 환으로서의 준동형과 같으며, 체 사이의 환 준동형을 체의 확대라고 한다. 체의 확대는 항상 단사 함수이다.
체는 해당 집합에 정의된 두 개의 이항 연산(덧셈, 곱셈)과 함께하는 집합으로, 유리수 및 실수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모든 원소 에 대한 덧셈 역원 와 모든 0이 아닌 원소 에 대한 곱셈 역원 이 존재하여, 빼기()와 나누기() 연산을 정의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체는 집합 와 상의 두 개의 이항 연산인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진다. 상의 이항 연산은 의 사상으로, 의 각 순서쌍의 원소에 의 유일하게 결정된 원소를 연관시킨다.[1][2][3]
이러한 연산들은 '체 공리'라고 하는 다음 성질들을 만족해야 한다. (체 의 모든 원소 , , 에 대해 성립)
- 덧셈과 곱셈의 결합 법칙: 및 .
-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 및 .
- 덧셈 및 곱셈 항등원: 및 를 만족하는 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소 과 이 존재한다.
- 덧셈 역원: 의 모든 에 대해, 을 만족하는 의 '덧셈 역원' 가 존재한다.
- 곱셈 역원: 의 모든 에 대해, 을 만족하는 의 '곱셈 역원' (또는 )가 존재한다.
-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
체는 네 개의 이진 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필요한 속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0으로 나누기는 정의상 제외된다.[4] 존재 한정사를 피하기 위해, 체는 두 개의 이진 연산(덧셈과 곱셈), 두 개의 단항 연산(각각 덧셈 및 곱셈 역원을 생성), 그리고 두 개의 영항 연산(상수 및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산은 위 조건들을 따른다. 존재 한정사를 피하는 것은 구성적 수학과 컴퓨팅에서 중요하다.[5]
2. 2. Alternative definition (대안적 정의)
체는 집합 와 상의 두 이항 연산인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진다.[1] 상의 이항 연산은 의 사상, 즉 의 각 순서쌍의 원소에 의 유일하게 결정된 원소를 연관시키는 대응이다.[2][3] 와 의 덧셈 결과는 와 의 합이라고 하며, 로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와 의 곱셈 결과는 와 의 곱이라고 하며, 또는 로 표기한다. 이러한 연산은 '체 공리'라고 하는 다음 성질들을 만족해야 한다.이 공리들은 체 의 모든 원소 , , 에 대해 성립해야 한다.
- 덧셈과 곱셈의 결합 법칙: 및 .
-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 및 .
- 덧셈 및 곱셈 항등원: 및 를 만족하는 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소 과 이 존재한다.
- 덧셈 역원: 의 모든 에 대해, 을 만족하는 의 '덧셈 역원'이라고 불리는 의 원소, 가 존재한다.
- 곱셈 역원: 의 모든 에 대해, 을 만족하는 의 '곱셈 역원'이라고 불리는 또는 로 표기되는 의 원소가 존재한다.
-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 .
동등하고 더 간결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체는 덧셈과 곱셈이라는 두 개의 가환 연산을 가지고 있으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인 덧셈에 대한 군이다. 0이 아닌 원소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인 곱셈에 대한 군을 형성하며, 곱셈은 덧셈에 분배된다.
더욱 간결하게 표현하면 체는 이고 모든 0이 아닌 원소가 곱셈에 대해 가역원인 가환환이다.
체는 다르고 동등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체는 네 개의 이진 연산(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필요한 속성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0으로 나누기는 정의상 제외된다.[4] 존재 한정사를 피하기 위해, 체는 두 개의 이진 연산(덧셈과 곱셈), 두 개의 단항 연산(각각 가법 및 곱셈 역원을 생성), 그리고 두 개의 영항 연산(상수 및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산은 위 조건들을 따른다. 존재 한정사를 피하는 것은 구성적 수학과 컴퓨팅에서 중요합니다.[5] 동일하게 두 개의 이진 연산, 하나의 단항 연산(곱셈 역원)과 두 개의 (반드시 구별될 필요는 없는) 상수 과 로 체를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및 이기 때문이다.
3. 성질
체는 환론, 범주론, 모형 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
- 모든 체는 유클리드 정역이며, 따라서 주 아이디얼 정역, 유일 인수 분해 정역, 데데킨트 정역, 정역이다.[1]
- 체는 덧셈과 곱셈, 두 연산을 갖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체는 덧셈에 대해 아벨 군이고, 0을 제외한 원소들은 곱셈에 대해 아벨 군을 이루며, 곱셈은 덧셈에 대해 분배 법칙을 따른다.
- 체의 곱셈군의 모든 유한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 모든 체는 '''체의 표수'''로 분류된다. 표수는 0이거나 소수이다.[9]
- (단위원 1을 n회 더한 것)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가 없다면, 체는 표수 0을 갖는다.[11]
- 위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가 있다면, 그러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소수이며, 이 경우 체는 해당 소수를 표수로 갖는다.
- 모든 체 ''F''는 고유한 부분체가 없는 소수체를 포함한다. ''F''의 표수가 소수 ''p''이면, 소수체는 유한체와 동형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체는 '''Q'''와 동형이다.[14]
3. 1. 환론적 성질
모든 체는 유클리드 정역이며, 따라서 주 아이디얼 정역, 유일 인수 분해 정역, 데데킨트 정역, 정역이다.[1]가환환 에 대하여, 다음 조건들은 서로 동치이다.
따라서, 체 의 스펙트럼(=0차원 -아핀 공간) 는 한원소 공간이다.
체 위의 모든 가군은 자유 가군이며, 이러한 가군을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3. 2. 범주론적 성질
체와 체의 확대의 범주 는 가환환의 범주 의 충만한 부분 범주이다. 이 범주에서는 곱이나 쌍대곱이 존재하지 않는다.집합의 범주로 가는 망각 함자 가 존재한다. 다른 대수 구조의 범주와 달리, 망각 함자는 수반 함자를 갖지 않는다. 즉, "자유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체의 모임이 대수 구조 다양체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체의 범주에서, 모든 사상은 단사 사상이다. 체의 범주는 연결 범주가 아니며, 연결 성분들은 각 체의 표수 에 대한, 표수 의 체들의 범주 이다. 의 시작 대상은 유한체 () 또는 유리수체 ()이다. 끝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3. 3. 모형 이론적 성질
체는 가환환의 부호수 의 대수 구조이다. 체는 1차 논리로 공리화할 수 있다. 완전체, 대수적으로 닫힌 체 등은 1차 논리로 공리화할 수 있으며, "체의 표수가 "라는 사실 역시 1차 논리로 공리화할 수 있다. 반면, 어떤 체가 유한체라는 사실은 1차 논리로 공리화할 수 없다. 즉, 유한체의 1차 논리 이론은 무한 모형을 갖는다. 주어진 표수의 대수적으로 닫힌 체의 이론은 모든 비가산 크기에서 유일성(categoricity|캐터고리성영어)을 보인다. 즉, 주어진 표수 및 비가산 크기의 대수적으로 닫힌 체들은 모두 서로 동형이다.[1]3. 4. 덧셈군과 곱셈군
이 절에서 는 임의의 체를 나타내고, 와 는 의 임의의 원소를 나타낸다.다음이 성립한다.
- 및 . 특히 을 알면 모든 원소의 덧셈 역원을 추론할 수 있다.[9]
- 만약 이면 또는 는 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면 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체가 정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임의의 원소 와 에 대해 다음 성질이 성립한다.
- 만약 이라면
장의 공리 는 덧셈 하에서 아벨 군임을 의미한다. 이 군은 장의 덧셈군이라고 하며, 로만 나타내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을 때 로 표시하기도 한다. 체 ''K''가 주어졌을 때, 그 곱셈 구조를 잊고 덧셈에 관한 아벨 군으로 보았을 때의 대수계 를 체 ''K''의 '''덧셈군'''이라고 부른다. 덧셈군은 나 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의 ''0이 아닌'' 원소들은 곱셈 하에서 아벨 군을 형성하며, 이를 곱셈군이라고 하고, 또는 , 또는 로 나타낸다. 곱셈 구조에만 주목하여 0을 제외한 ''K''의 원 전체 에 곱셈을 부여하여 얻어지는 대수계 는 군이며, '''곱셈군'''이라고 불린다. ''K''의 곱셈군은 종종 로도 표기하며, 로 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은 덧셈과 곱셈으로 표시되는 두 연산을 갖춘 집합 로 정의할 수 있으며, 는 덧셈에 대해 아벨 군이고, 는 곱셈에 대해 아벨 군이며(여기서 0은 덧셈의 항등원), 곱셈은 덧셈에 대해 분배 법칙을 따른다. 따라서 장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명제는 군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덧셈 및 곱셈 역원 와 는 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된다.
이라는 요구 사항은 단일 원소로 구성된 자명환을 제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부과되며, 이는 장을 정의하는 공리의 모든 선택을 안내한다.
체의 곱셈군의 모든 유한 부분군은 순환군이다(''순환군'' 참조). 체 ''K''의 곱셈군의 임의의 유한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3. 5. 표수
모든 체는 '''체의 표수'''로 일차적으로 분류된다. 표수는 0이거나 소수이다.[9]만약 (단위원 1을 n회 더한 것)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가 없다면, 체는 표수 0을 갖는다고 말한다.[11] 예를 들어, 유리수체는 어떤 양의 정수도 0이 아니므로 표수 0을 갖는다. 그렇지 않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가 있다면, 그러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소수이며, 일반적으로 로 표시된다. 이 경우 체는 표수 를 갖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체 는 (위의 덧셈 표기법에서) 이므로 표수 2를 갖는다.
만약 체 가 표수 를 갖는다면, 는 의 모든 에 대해 성립한다. 표수가 p인 체에서 프로베니우스 사상은 체 준동형사상이다.[12]
''n''1이 단위원 1을 ''n''회 더한 것을 나타낼 때, ''n''1 = 0이 되는 양의 정수 ''n''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그 체의 표수라고 한다. 단, 그러한 ''n''이 존재하지 않을 때 표수는 0으로 정한다. 체의 표수는 0 또는 소수이다.
3. 6. 부분체와 소체
체 ''F''의 '''부분체''' ''E''는 ''F''의 체 연산에 대해 체를 이루는 ''F''의 부분집합이다. 즉, 1을 포함하고, 덧셈, 곱셈, 덧셈의 가법 역원, 그리고 0이 아닌 원소의 곱셈 역원에 대해 닫혀 있는 ''F''의 부분집합이다. 이는 이며, 모든 에 대해 와 가 모두 ''E''에 속하고, 모든 0이 아닌 에 대해 와 가 모두 ''E''에 속함을 의미한다.체는 고유한(즉, 엄격하게 작은) 부분체가 없는 소수체를 포함한다. 모든 체 ''F''는 소수체를 포함한다. ''F''의 표수가 ''p'' (소수)이면, 소수체는 유한체와 동형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체는 '''Q'''와 동형이다.[14]
4. 분류
모든 체는 체의 표수로 일차적으로 분류된다. 표수는 0이거나 소수이다.
모든 체는 다음과 같은 체의 확대로 나타낼 수 있다.
:
- 는 유한체 (인 경우) 또는 유리수체 (표수가 0인 경우)와 동형이다.
- 는 순수 초월 확대이다. 즉, 는 유리 함수체 와 동형이다. 이러한 초월 확대는 기수인 초월 차수 로서 완전히 분류된다.
- 는 대수적 확대이다. 즉, 는 대수적 폐포 의 부분체이다. 이러한 대수적 확대는 일차적으로 차수 로서 분류되나, 일반적인 분류는 모든 대수다양체의 (유리 함수체의) 분류와 동치이므로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특정 종류의 체들은 완전히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든 유한체는 집합의 크기에 의하여 완전히 분류되고, 모든 대수적으로 닫힌 체는 표수와 초월 차수에 의하여 완전히 분류된다.
유한체는 유한 개의 원소를 갖는 체로, 그 원소의 개수를 체의 차수라고도 한다. 가장 간단한 유한체는 소수 차수를 갖는 유한체로, 모듈러 산술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개의 원소를 갖는 체는 로 표시된다. 모든 유한체 는 개의 원소를 가지며, 여기서 는 소수이고 이다. 개의 원소를 갖는 체는 다항식 의 분해체로 구성될 수 있다.[15][16] 차수가 같은 두 유한체는 동형이므로, 개의 원소를 갖는 유한체는 또는 로 표시한다.
5. 예
- 유리수 전체 '''Q'''는 체이다.
- 실수 전체 '''R'''나 복소수 전체 '''C'''도 체이다.
- {0, 1}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연산을 정의하면, 이는 이원체(GF(2))라고 불리는 체가 되며, '''F'''₂ 등으로 표기한다. 이 체는 부호 이론 등에 응용되고 있다.
- ''p''를 소수라고 할 때, 집합 {0, 1, …, ''p'' - 1}에 연산을 정의하여 유한체를 만들 수 있다. 이 체는 '''F'''''p'', '''Z'''/''p'''''Z''' 또는 GF(''p'') 등으로 표기한다.
- 대수적 수론에서는 대수적 수체들을 다루며, 주요 예로는 이차 수체와 원분체가 있다.
- 대수기하학에서는 대수다양체 위의 유리 함수체를 다룬다.
- 체 ''k'' 위의 유리 함수 전체 ''k''(''x''1, …, ''x''n)도 체이다.
- 체 ''k'' 위의 형식적 로랑 급수 전체 ''k''((''x''1, …, ''x''n''))도 체이다.
- 대수적 수 전체 나 대수적인 실수의 전체 ∩ '''R'''도 체이다.
- 소수 ''p''에 대해 ''p''진수 전체 '''Q'''''p''도 체이다.
- 자, 컴퍼스로 작도 가능한 복소수(작도 가능 수) 전체나 실수(작도 가능 실수) 전체도 체이다.
- 초실수체 는 비표준 해석학에서 쓰이는 체이며, 비아르키메데스 체의 예이다.
- 초현실수의 모임은 집합을 이루지 않으므로, 엄밀히 말해서는 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면, 이는 "체"를 이루는 고유 모임이 된다.
- p진수체 는 유리수체의 확대의 하나이며, 비아르키메데스 체의 예이다.
- 주어진 체 에 대하여, 유리 함수체 및 형식적 로랑 급수체 및 퓌죄 급수체 역시 체를 이룬다.
- 정역 가 주어졌을 때, 꼴의 비들은 분수체라는 체를 이룬다.
- 모든 소수 및 양의 정수 에 대하여, 크기가 인 체는 유일하게 존재하며, 이를 '''유한체''' 라고 쓴다. 이는 표수가 인 체이다. 와 같은 꼴이 아닌 크기의 유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5. 1. 유리수
유리수의 집합 는 체이다.[6] 유리수는 체의 개념이 정립되기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유리수는 분수 (정수, )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다. 분수 의 덧셈 역원은 이며, 곱셈 역원 (인 경우)은 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체 공리는 유리수의 표준적인 성질로 축약된다. 예를 들어, 분배 법칙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6]
:
5. 2. 실수와 복소수
실수(Real number|레알 넘버영어)()는 덧셈과 곱셈의 일반적인 연산을 통해 체를 형성한다. 복소수()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구성된다.[1]: (여기서 , 는 실수이고, 는 허수 단위)
실수의 덧셈과 곱셈은 이러한 유형의 표현이 모든 체 공리를 만족하고 에 대해 성립하도록 정의된다. 예를 들어, 분배 법칙은 다음을 적용한다.[1]
:
복소수는 평면에서 점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데카르트 좌표는 표현을 설명하는 실수로 주어지거나, 원점에서 이러한 점까지의 화살표로 표현되며, 길이를 사용하고, 명확한 방향과 닫힌 각도를 지정한다. 덧셈은 직관적인 평행사변형으로 화살표를 결합하는 것(데카르트 좌표를 더하는 것)에 해당하고, 곱셈은 화살표의 회전과 스케일링을 결합하는 것(각도를 더하고 길이를 곱하는 것)에 해당한다.[1]

실수와 복소수의 체는 수학, 물리학, 공학, 통계학 및 기타 많은 과학 분야에서 사용된다.[1]
5. 3. 작도 가능한 수
고대에는 몇몇 기하학적 문제들이 자와 컴퍼스를 사용하여 특정 숫자를 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주어진 각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삼등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작도 가능한 수 분야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7] 실수 작도 가능 수는, 정의에 따르면 0과 1의 점으로부터 컴퍼스와 자만 사용하여 유한한 단계로 작도할 수 있는 선분 길이이다. 이러한 수들은 실수 작도 가능 수로 제한된 체 연산을 갖추고 있으며, 유리수 체를 포함하는 체를 형성한다.
모든 실수가 작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 는 작도 가능한 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제시한 또 다른 문제인 부피가 2인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를 자와 컴퍼스로 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4. 네 원소를 갖는 체
{| class="wikitable floatright"|+
! 덧셈
! 곱셈
|-
!
!
|}
유리수와 같은 친숙한 수 체계 외에도 다른 체의 예가 있다. ''O''|오영어, ''I''|아이영어, ''A''|에이영어, ''B''|비영어의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된 체가 그 예시이다. 여기서 ''O''|오영어는 덧셈 항등원(0으로 표시됨)의 역할을 하고, ''I''|아이영어는 곱셈 항등원(1로 표시됨)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체 공리는 직접 계산하거나 더 많은 체 이론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배 법칙에 따라 ''A''|에이영어 ⋅ (''B''|비영어 + ''A''|에이영어) = ''A''|에이영어 ⋅ ''I''|아이영어 = ''A''|에이영어이며, 이는 ''A''|에이영어 ⋅ ''B''|비영어 + ''A''|에이영어 ⋅ ''A''|에이영어 = ''I''|아이영어 + ''B''|비영어 = ''A''|에이영어와 같다.
이 체는 네 개의 원소를 가진 유한체 또는 '''갈루아 체'''라고 하며, 또는 로 표시된다.[8] ''O''|오영어와 ''I''|아이영어로 구성된 부분 집합(위 표에서 빨간색으로 강조됨)은 또는 로 알려진 이진 체이다.
6. 역사
체의 개념은 다항 방정식의 해법 문제, 대수적 수론, 대수 기하학이라는 세 가지 대수적 분야에서 발전하였다.[17] 1770년 조제프루이 라그랑주는 세제곱 다항식의 근을 순열하여 얻는 식이 단 두 개의 값만 생성한다는 것을 관찰하여 체 개념의 첫 단계를 밟았다. 그는 스키피오 델 페로와 프랑수아 비에트의 고전적인 풀이 방법을 개념적으로 설명했다.[18] 라그랑주는 4차 방정식에 대한 유사한 관찰과 함께 체와 군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만들었다.[19] 알렉상드르테오필 방데르몽드와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는 ''산술의 연구''(1801)에서 소수 방정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순환 갈루아 군을 연구했다. 가우스는 이를 통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정n각형을 작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파올로 루피니는 오차 방정식이 대수적으로 풀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주장은 결함이 있었고, 1824년 닐스 헨리크 아벨이 이 틈을 메웠다.[20] 1832년 에바리스트 갈루아는 다항 방정식이 대수적으로 풀릴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고안하여 갈루아 이론을 확립했다. 아벨과 갈루아는 대수적 수체를 사용했지만, 체나 군의 명시적인 개념은 없었다.
1871년 리하르트 데데킨트는 실수 또는 복소수 집합에 대해 "몸체"를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 ''Körper''를 도입했다.[21] 영어 용어 "field"는 1893년 무어(Moore)에 의해 도입되었다.[22]
1881년 레오폴트 크로네커는 ''합리성의 영역''을 정의했는데, 이는 현대적인 용어로 유리식의 체이다. 크로네커의 개념은 모든 대수적 수의 체를 포함하지 않았지만, 체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을 하지 않아 데데킨트의 개념보다 추상적이었다. 그는 체 Q(π)를 추상적으로 합리 함수 체 Q(X)로 해석했다. 이전에는 조제프 리우빌의 연구를 통해 초월수의 예가 알려졌으며, 샤를 에르미트와 페르디난트 폰 린데만은 각각 e와 π의 초월성을 증명했다.[23]
1893년 하인리히 마틴 베버는 추상 체에 대한 첫 번째 명확한 정의를 제시했다.[24] 베버의 개념에는 체 Fp가 포함되었다. 주세페 베로네세는 형식적 멱급수의 체를 연구했고, 이는 쿠르트 헨젤로 하여금 p-진수의 체를 도입하도록 이끌었다. 1910년 에른스트 슈타이니츠는 추상 체 이론에 대한 지식을 종합하고 공리적으로 연구했다. 갈루아 이론, 체 구성, 기본적인 개념 섹션의 대부분 정리는 슈타이니츠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1927년 에밀 아르틴과 오토 슈라이어는 체에서의 순서 개념을 연구했다.[25] 에밀 아르틴은 1928년부터 1942년까지 갈루아 이론을 재개발하여, 원시 원소 정리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했다.
7. 구성
가환환에서 체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분수체 구성과 잉여체 구성 두 가지가 있다. 분수체 구성은 정역에서 유리수를 구성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두 원소의 분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체를 만든다. 예를 들어 정수 '''Z'''|Z영어의 분수체는 유리수 '''Q'''|Q영어이다. 잉여체 구성은 가환환의 극대 아이디얼을 이용한 몫환을 통해 체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Z'''|Z영어의 잉여체는 유한체 '''F'''''p''|Fp영어이다.
7. 1. 환으로부터의 구성
가환환은 덧셈과 곱셈 연산이 정의되어 있으며, 곱셈의 역원 ''a''−1|a의 -1제곱영어의 존재를 제외한 모든 체의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이다.[26] 예를 들어, 정수 '''Z'''|Z영어는 가환환을 이루지만, 체는 아니다. 정수 의 역수는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이다.대수적 구조의 계층에서 체는 모든 0이 아닌 원소가 단원 (즉, 모든 원소가 가역원)인 가환환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체는 정확히 두 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얼, 과 을 갖는 가환환이다. 체는 또한 이 유일한 소 아이디얼인 가환환이기도 하다.
가환환 이 주어지면, 과 관련된 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모든 0이 아닌 원소가 가역원이 되도록 을 수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수체 구성과 잉여체 구성이 그것이다. '''Z'''|Z영어의 분수체는 유리수 '''Q'''|Q영어이고, '''Z'''|Z영어의 잉여체는 유한체 '''F'''''p''|Fp영어이다.
7. 2. 분수체
정역 이 주어졌을 때, 그 분수체 는 정수에서 '''Q'''를 구성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의 두 원소의 분수로 구성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 원소는 와 가 에 있고, 인 분수 이다. 두 분수 와 는 일 때 그리고 그 때만 같다. 분수에 대한 연산은 유리수와 정확히 같다. 예를 들어,:
링이 정역이면, 분수의 집합이 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다.[27]
체 (또는 정역) 위의 유리 분수의 체 는 다항식 환 의 분수체이다. 로랑 급수의 체
:
체 위는 형식적 멱급수의 환 (여기서 )의 분수체이다.
7. 2. 1. 잉여체
가환환에서 전사 사상을 통해 필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은 모든 필드는 몫환 형태이며, 여기서 은 의 극대 아이디얼이다. 만약 이 국소환이고 단 하나의 극대 아이디얼 만을 가진다면, 이 필드는 의 잉여류체라고 불린다.[28]단일 다항식에 의해 생성된 아이디얼 는 다항식환 ( 위에서)에서 가 에서 기약 다항식일 때, 즉 가 내에서 더 작은 차수의 두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될 수 없을 때 극대 아이디얼이 된다. 이것은 다음 필드를 생성한다.
:
이 필드 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소 (즉, 의 잉여류)를 포함한다.
:
예를 들어, C는 R로부터 허수 단위 기호 를 합성함으로써 얻어지며, 이 기호는 을 만족한다. 여기서 이다. 게다가, 는 위에서 기약적이므로, 다항식 를 로 보내는 사상은 동형사상을 생성한다.
:
7. 3. 더 큰 체 안에서의 구성
주어진 더 큰 체 안에서 부분체를 구성할 수 있다. 체 E와 E를 부분체로 포함하는 체 F가 주어졌다고 가정할 때, F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 E와 x를 포함하는 F의 가장 작은 부분체가 존재하며, 이를 'x'에 의해 생성된 F의 부분체라고 하며 E(x)로 표기한다.[29] E에서 E(x)로의 변환을 E에 '원소의 합체'라고 한다. 더 일반적으로, 부분 집합 S ⊂ F에 대해, E와 S를 포함하는 F의 최소 부분체가 존재하며, 이를 E(S)로 표기한다.어떤 체 F의 두 부분체 E와 E'의 합성체는 E와 E'를 모두 포함하는 F의 가장 작은 부분체이다.
8. 추가 구조를 갖는 체
체는 특정 분야의 요구에 맞춰 그 개념을 확장한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
대수적으로 닫힌 체는 임의의 다항 방정식에 대해, 그 방정식의 해가 항상 그 체 안에 존재하는 체이다.[33] 예를 들어,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 복소수 체는 대수적으로 닫혀있다. 반면, 유리수와 실수 체는 방정식 `x`2 + 1 = 0 의 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수적으로 닫혀있지 않다. 어떤 체 `F`를 포함하는 체가 `F`의 대수적 확대이면서 대수적으로 닫혀있다면, 이를 `F`의 ''대수적 폐포''라고 부른다. 모든 체는 대수적 폐포를 가지며, 이는 동형 사상까지 유일하다.[34]
아르틴-슈라이어 정리에 따르면, 대수적 폐포가 원래 체의 유한 확대인 특별한 경우, 확장의 차수는 반드시 2이고, 원래 체는 실수 체와 원소적으로 동치이다. 이러한 체는 실수 닫힌 체라고도 불린다.
8. 1. 순서체
실수 집합은 일반적인 순서 ≥를 가진 순서체를 이룬다. 아르틴-슈라이어 정리에 따르면 체는 다음 2차 방정식: x2 + x2 + ⋯ + x2 = 0
이 단지 해 x1 = x2 = ⋯ = xn = 0 만을 가질 경우에만 순서를 매길 수 있는데, 이는 체가 형식적으로 실수체임을 의미한다.[36] 고정된 체 F에 대한 모든 가능한 순서의 집합은 F상의 이차 형식의 비트 링 W(F)에서 '''Z'''로의 환 준동형 사상의 집합과 동형이다.[37]
아르키메데스 체는 각 원소에 대해 유한 표현식
: 1 + 1 + ⋯ + 1
의 값이 해당 원소보다 큰 순서체, 즉 무한 원소가 없는 순서체이다. 동치적으로 체는 무한소 (모든 유리수보다 작은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동치적으로, 체는 실수의 부분체와 동형이다.

순서체는 모든 상계, 하계 (''데데킨트 절단'' 참조) 및 극한이 존재해야 하는 경우 데데킨트 완비이다. 더 형식적으로, F의 각 유계 부분 집합은 최소 상계를 가져야 한다. 임의의 완비체는 반드시 아르키메데스 체이다.[38] 모든 비아르키메데스 체에는 최대 무한소도 최소 양의 유리수도 없으므로, 모든 원소가 모든 무한소보다 큰 수열 1/2, 1/3, 1/4, ...은 극한을 갖지 않는다.
실수의 모든 진부분체 또한 이러한 간극을 포함하므로 실수는 동형 사상까지 유일한 완비 순서체이다.[39] 미적분학의 여러 기본적인 결과는 이러한 실수의 특징에서 직접적으로 따른다.
초실수 '''R'''*는 아르키메데스 체가 아닌 순서체를 형성한다. 이는 무한수와 무한소를 포함하여 얻어진 실수의 확장이다. 이들은 각각 임의의 실수보다 크거나 작다. 초실수는 비표준 해석학의 기본적인 기반을 형성한다.
8. 2. 위상체
체의 연산(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이 연속 함수가 되는 위상 공간을 위상체라고 한다.[40] 체의 위상은 보통 거리 함수를 통해 정의되며, 이 함수는 체의 두 원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체 ''F''의 완비화는 원래 체 ''F''에 "틈"이 있다면 채워지는 또 다른 체이다. 예를 들어, 무리수는 유리수에 의해 임의로 가까이 근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수의 "틈"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는 완비화의 몇 가지 예시를 보여준다.
체 '''Q'''''p''는 수론과 ''p''-진법 해석에 사용된다. '''Q'''''p''의 대수적 폐포는 고유한 노름을 가지지만 완비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 대수적 폐포의 완비화는 대수적으로 닫혀 있으며, 복소 ''p''-진수의 체라고 불리며 '''C'''''p''로 표시된다.[41]
8. 2. 1. 국소체
다음 위상적 체들은 국소체라고 불린다.[42]- Q|p영어의 유한 확장 (표수가 0인 국소체)
- Corps de séries formelles de Laurent|로랑 급수체프랑스어 F|p((t))영어의 유한 확장 (표수가 p영어인 국소체).
이 두 종류의 국소체는 몇 가지 기본적인 유사점을 공유한다. 이 관계에서, 원소 p영어 ∈ Q|p영어와 t영어 ∈ F|p((t))영어 (\균등원)은 서로 대응된다. 이것의 첫 번째 징후는 초급 수준에서 나타난다. 두 체의 원소는 모두 F|p영어의 계수를 갖는 균등원의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Q|p영어에서의 덧셈은 자리올림을 사용하여 수행되는데, 이는 F|p((t))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 체들은 동형이 아니다.) 다음 사실은 이러한 표면적인 유사성이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 거의 모든 Q|p영어에 대해 참인 일계 논리 명제는 거의 모든 F|p((t))영어에 대해서도 참이다. 이것의 한 가지 적용은 Q|p영어에서 동차 다항식의 영점을 설명하는 악-코헨 정리이다.
- 두 체의 온순 분기 확장은 서로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 p영어 (Q|p영어에서) 또는 t영어 (F|p((t))영어에서)의 임의의 p영어 거듭제곱근을 추가하면, 이러한 체들의 (무한) 확장인 퍼펙토이드 체가 생성된다. 놀랍게도, 이 두 체의 갈루아 군은 동형이며, 이는 이 두 체 사이의 놀라운 평행성의 첫 번째 징후이다.[43]
8. 3. 미분체
미분이 갖춰진 체로, 체 내의 원소의 미분을 허용하는 체이다.[44] 예를 들어, 다항식의 표준 미분과 함께하는 체 R|아르영어(''X'')는 미분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체는 미분 갈루아 이론의 핵심이며, 선형 미분 방정식을 다루는 갈루아 이론의 변형이다.9. 갈루아 이론
갈루아 이론은 덧셈과 곱셈의 산술 연산에서의 대칭성을 연구하여 체의 대수적 확대를 연구한다. 이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은 유한 확대인 갈루아 확대 ''F'' / ''E''영어인데, 이는 정의에 따라 분리가능 확대와 정규 확대이다. 원시 원소 정리는 유한 분리 가능한 확대가 필연적으로 단순 확대임을 보여준다.[45]
유한 갈루아 확대의 경우, 갈루아 군 Gal(''F''/''E'')영어은 ''E''영어에서 자명한 ''F''영어의 체 자기 동형 사상의 군이다(즉, 덧셈과 곱셈을 보존하고 ''E''영어의 원소를 자신에게 보내는 전단사 함수 ''σ'' : ''F'' → ''F''영어). 이 군의 중요성은 갈루아 이론의 기본 정리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Gal(''F''/''E'')영어의 부분군 집합과 확대 ''F''/''E''영어의 중간 확대 집합 사이에 명시적인 일대일 대응을 구성한다.[46] 이러한 대응을 통해 군론적 속성은 체에 대한 사실로 변환된다.
10. 체의 불변량
체의 기본적인 불변량에는 표수와 소체에 대한 초월 차수가 있다. 초월 차수는 소체에 대해 대수적으로 독립인 체 내 원소의 최대 개수로 정의된다. 두 대수적으로 닫힌 체는 이 두 데이터가 일치할 경우에만 동형이다.[49] 예를 들어, ('''Q'''''p''한국어의 대수적 폐포), '''C'''''p''영어 ('''Q'''''p''한국어의 완비화의 대수적 폐포)와 '''C'''영어 (복소수체)는 (위상적인 체로서는 동형이 아니지만) 동형이다.
10. 1. 체의 모형 이론
모형 이론의 한 분야인 수학적 논리에서, 두 체 E영어와 F영어는 E영어에 대해 참인 모든 수학적 명제가 F영어에 대해서도 참이고 그 반대도 성립할 경우 기본적으로 동치라고 한다. 이때 문제의 수학적 명제는 0, 1, 덧셈과 곱셈을 포함하는 1차 논리 문장이어야 한다. n > 0영어이고 n영어이 정수인 경우, 전형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E영어의 차수 n영어인 모든 다항식은 E영어에서 영점을 가진다."
모든 n영어에 대한 이러한 공식들의 집합은 E영어가 대수적으로 닫혀 있음을 나타낸다.
Lefschetz 원리는 C영어가 표수가 0인 모든 대수적으로 닫힌 체 F영어와 기본적으로 동치임을 명시한다. 더욱이, 고정된 문장 φ영어는 C영어에서 참일 경우에만 충분히 높은 표수의 모든 대수적으로 닫힌 체에서 참이다.[50]
만약 U영어가 집합 I영어에 대한 초여과기이고, Fi영어가 I영어의 모든 i영어에 대한 체라면, U영어에 대한 Fi영어의 초곱은 체이다.[51] 이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 ulimi→∞ Fi영어
이는 여러 면에서 체 Fi영어의 극한처럼 동작하기 때문이다. Łoś 정리는 거의 모든 Fi영어에 대해 참인 모든 1차 논리 문장이 초곱에도 참이라고 명시한다. 위의 문장에 적용하면, 다음 동형사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
위에 언급된 Ax–Kochen 정리는 또한 이와 초곱의 동형사상(두 경우 모두 모든 소수 p영어에 걸쳐)에서 다음과 같이 따른다.
: ulimp Qp ≅ ulimp Fp((t))영어.
더욱이, 모형 이론은 또한 실수 닫힌 체나 지수 체와 같은 다양한 다른 유형의 체의 논리적 속성을 연구한다(지수 함수 exp : F → F×영어가 갖춰져 있음).[52]
10. 2. 절대 갈루아 군
절대 갈루아 군은 대수적으로 닫힌 체나 가분적으로 닫힌 체가 아닌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유한 갈루아 확장의 경우를 확장하여, 이 군은 F의 모든 유한 가분 확장을 지배한다. 기본적인 수단을 통해, 군 F_q는 프뤼퍼 군이며, Z의 프로유한 완비화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설명은 F_q의 유일한 대수적 확장이 F_q^n인 체이고, 이 유한 확장의 갈루아 군이 Gal(F_q^n / F_q) = Z/nZ라는 사실을 포함한다.[53] 생성자와 관계를 통해 p-진수체(Q_p의 유한 확장)의 갈루아 군을 설명할 수도 있다.11. 응용
체는 선형대수학, 가환대수학, 암호학, 부호 이론, 기하학, 수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된다.
11. 1. 선형대수학과 가환대수학
만약 가 0이 아니면, 다음 방정식:
는 체에서 유일한 해 를 가지며, 이는 이다. 이는 체의 정의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선형대수학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는 가우스 소거법과 모든 벡터 공간이 기저를 갖는다는 증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55]
11. 2. 유한체: 암호학과 부호 이론
유한체는 이산 지수화, 타원 곡선 암호 등 암호학적 알고리즘에 사용된다. 유한체에서의 곱셈은 타원 곡선 위의 점을 더하는 연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

이산 지수화, 즉
: (개의 인자, 정수 에 대해)
를 큰 유한체 에서 계산하는 것은 역 연산인 이산 로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산 로그는 방정식
:
의 해 을 결정하는 것이다.
유한체는 부호 이론에서 오류 정정 부호를 구성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유한체는 조합론에도 사용된다.
11. 3. 기하학: 함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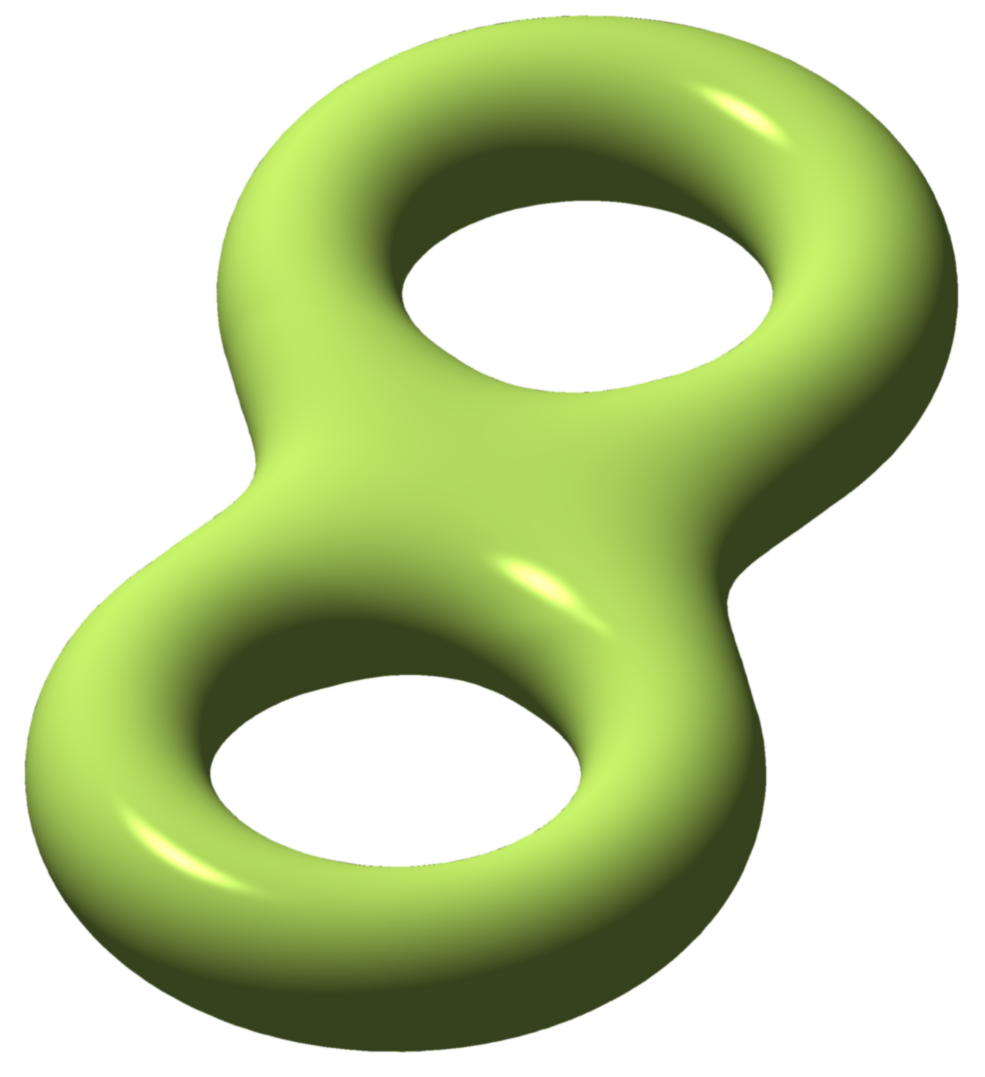
대수적 다양체(다항식 방정식의 공통 영점으로 정의된 기하학적 객체)의 함수체는 정칙 함수, 즉 다양체에 대한 다항식 함수의 비율로 구성된다. 체 ''F'' 위의 ''n''-차원 공간의 함수체는 ''F''(''x''1, ..., ''x''''n'')이며, ''n''개의 미지수에 대한 다항식의 비율로 구성된 체이다. ''X''의 함수체는 모든 열린 조밀한 부분 다양체의 함수체와 동일하다. 즉, 함수체는 ''X''를 (약간) 작은 부분 다양체로 대체하는 것에 민감하지 않다.
함수체는 다양체의 동형 사상 및 쌍유리 동치에 불변이다. 따라서 추상 대수적 다양체의 연구와 대수적 다양체의 분류에 중요한 도구이다. 예를 들어, ''F''(''X'')의 초월 차수와 같은 차원은 쌍유리 동치에 불변이다.[56] 곡선(차원이 1)의 경우, 함수체 ''F''(''X'')는 ''X''에 매우 가깝다. ''X''가 매끄러운 다양체이고 고유 사상일 경우 (\[\[콤팩트 위상 공간|콤팩트]]인 것과 유사), ''X''는 함수체로부터 동형 사상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함수체가 덜 기억되지만, ''X''에 대한 여전히 결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고차원에서 함수체와 그 기하학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쌍유리 기하학이라고 한다. 최소 모형 프로그램은 지정된 함수체를 가진 가장 간단한 (어떤 정확한 의미에서) 대수적 다양체를 식별하려고 시도한다.
11. 4. 수론: 전역체
전역체는 대수적 수론과 산술 기하학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57] 전역체는 수체(Q의 유한 확장) 또는 Fq 위의 함수체(Fq(t)의 유한 확장)이다. 국소체와 마찬가지로, 이 두 종류의 체는 각각 표수 0과 양의 표수를 갖지만,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한다.류체론은 가환 갈루아 군을 갖는 확대체, 즉 전역체의 가환화된 갈루아 군을 설명한다. 크로네커-베버 정리는 Q의 최대 가환 확대체인 Qab를 설명하는데, 이는 모든 원시 n차 단위근을 붙여서 얻어진다.
일반 수체 F의 Fab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찾는 문제는 크로네커의 유겐트라움으로 불린다. 허수 이차체 ($d>0$)의 경우, 복소수 곱셈 이론을 통해 타원 곡선을 사용하여 Fab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시적인 설명이 알려져 있지 않다.
12. 관련 개념
사원수, 준체, 근체, 반체와 같이 체와 관련된 다양한 다른 약한 대수 구조가 있다.[60] 하나의 원소를 갖는 체는 유한체 '''F'''''p''영어의 극한으로 제안되는 개념이며, 이때 ''p''영어는 1영어에 가깝다.[60]
12. 1. 사체 (Division rings)
장의 정의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공리를 제거하면 다른 대수 구조가 생성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환환은 곱셈 역원의 존재를 제외한 모든 장 공리를 만족한다. 곱셈의 가환성을 제거하면 '''사체''' 또는 '''왜곡체'''의 개념이 생성된다.[62] 때로는 결합성도 약화된다. 유한 차원 실수 벡터 공간인 유일한 사체는 실수체 , 복소수체 (이는 장이다) 및 사원수 (곱셈이 비가환)이다. 이 결과는 프로베니우스 정리로 알려져 있다. 곱셈이 가환적이지도 결합적이지도 않은 8원수는 노름 교대 나눗셈 대수이지만 사체는 아니다. 이 사실은 1958년 미셸 케르베르, 라울 보트, 존 밀너에 의해 대수적 위상수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증명되었다.[62]웨더번의 작은 정리는 모든 유한 사체는 장이라고 명시한다.
참조
[1]
서적
[2]
서적
[3]
서적
[4]
서적
[5]
서적
[6]
서적
[7]
서적
[8]
서적
[9]
서적
[10]
서적
[11]
서적
[12]
서적
[13]
서적
[14]
서적
[15]
서적
[16]
서적
[17]
서적
[18]
서적
[19]
서적
[20]
서적
[21]
웹사이트
"Earliest Known Uses of Some of the Words of Mathematics (F)"
http://jeff560.tripo[...]
[22]
서적
[23]
서적
[24]
서적
[25]
서적
[26]
서적
[27]
서적
[28]
서적
[29]
서적
[30]
서적
[31]
서적
[32]
서적
[33]
서적
[34]
간행물
Mathoverflow post
https://mathoverflow[...]
[35]
서적
[36]
서적
[37]
서적
[38]
서적
[39]
서적
[40]
서적
[41]
서적
[42]
서적
[43]
서적
[44]
서적
[45]
서적
[46]
서적
[47]
서적
[48]
서적
[49]
서적
[50]
서적
[51]
서적
[52]
서적
[53]
서적
[54]
서적
[55]
서적
[56]
서적
[57]
서적
[58]
서적
[59]
서적
[60]
서적
[61]
서적
[62]
서적
[63]
문서
本記事において単に体と言った場合「可換」体を意味するものとする。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