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한국 요리는 한반도에서 발전해 온 전통 음식 문화를 의미한다. 수렵과 채집 시대를 거쳐 농경 사회로 발전하면서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형성되었고, 삼국 시대에는 밥과 반찬을 구분하는 한국 고유의 식사 형태가 자리 잡았다. 고려 시대에는 몽골의 영향을 받아 만두, 국수, 양념 사용이 증가했으며, 조선 시대에는 농업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작물이 도입되어 식재료가 풍부해졌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식량 부족과 서구 음식의 유입 등 변화를 겪었으며,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 다양한 가공 식품과 육류 소비가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2009년부터 요리 외교를 통해 한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국 요리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 찌개, 구이, 전, 찜, 회, 나물, 김치 등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이다. 밥상에는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과 같은 상차림이 있으며, 음식의 종류는 밥, 죽, 떡, 국수, 만두, 찌개, 탕, 구이, 전, 찜, 회, 젓갈, 장, 김치, 떡, 한과, 음료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의 지역별로 향토 음식이 발달했으며, 제사, 명절 등 의례에 따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다. 불교의 영향으로 사찰 음식도 발전했으며, 궁중 음식은 왕실의 호화로운 식단을 보여준다. 한식은 세계화와 함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으며,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고, 나트륨 섭취가 많다는 점, 위생 문제, 외국인들의 거부감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한국 요리 - 호박죽
호박죽은 늙은 호박이나 단호박을 삶아 으깬 후 찹쌀가루 등을 넣어 끓여 만든 한국 전통 음식이다. - 한국 요리 - 애호박
애호박은 한국 요리에서 볶음, 전,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채소이며, 말린 형태인 호박고지는 볶음이나 나물로 조리되고 궁중 요리에도 사용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역사
(내용 없음)
2. 1. 선사 시대
즐문토기 시대 (기원전 약 8000년 ~ 기원전 1500년)에는 주로 수렵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었으며, 어업과 사냥이 중요한 활동이었다. 이 시대 후기에는 초기 형태의 농업도 시작되었다.[4] 이후 무문토기 시대 (기원전 약 1500년 시작)에는 만주 요하 유역에서 새로운 집단이 이주해 오면서 농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조, 보리, 밀, 콩, 쌀 등을 재배했으며, 여전히 사냥과 어업도 병행되었다.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이 시기에 콩을 발효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북쪽의 유목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가축을 기르는 기술도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2. 2. 삼국 시대

삼국 시대 (기원전 57년 ~ 서기 668년)는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고구려 (기원전 37년 ~ 서기 668년)는 한반도 북부와 현재 만주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다. 백제 (기원전 18년 ~ 서기 660년)는 한반도 남서부에, 신라 (기원전 57년 ~ 서기 935년)는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했다.
각 나라는 고유한 문화와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백제는 차가운 음식과 김치와 같은 발효 식품으로 유명했다. 고구려 사람들은 발효 음식을 잘 만들고 즐겨 먹었는데, 이는 가장 초기의 김치 형태로 여겨진다.[7]
서기 4세기경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불교와 유교가 전파되면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2. 3. 고려 시대

고려 후기인 13세기에는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다. 오늘날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부 전통 음식은 이 시기에 기원한다. 만두 요리인 만두, 구운 고기 요리, 국수 요리, 그리고 후추와 같은 양념의 사용은 모두 이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2. 4.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는 농업 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특히 15세기에는 측우기가 발명되는 등 중요한 혁신이 있었다. 1429년에는 세종 임금의 명으로 농업 기술 서적인 농사직설이 편찬되어 보급되었다.[8]조선 전기에 겪었던 여러 차례의 외침은 후기 사회와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다. 실학 학자들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에는 중국, 일본, 유럽, 필리핀 등과의 교역을 통해 신대륙에서 유래한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왔다. 옥수수, 고구마, 고추, 토마토, 땅콩, 호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감자와 고구마는 이전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땅에서도 잘 자라 널리 재배되었다.
정부 역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복잡한 관개 시스템을 건설하고 세금을 낮춰주어 농민들이 더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자급자족을 넘어 환금 작물 재배로 이어졌다. 세금 감면 정책은 상업 발달에도 기여하여, 5일마다 열리는 정기 시장이 활성화되었다. 19세기에는 이러한 시장이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달하며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장소로 기능했다.
조선 시대 말기에는 서구 세계, 중국, 일본과의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 1860년대에는 일본의 요구로 서양 국가들과 통상 조약을 맺고 항구를 개방하게 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서방 국가들과 교류가 시작되면서 문화와 음식의 교류도 늘어났다. 서양 선교사들이 새로운 식재료와 요리법을 소개했고, 왕실에 고문이나 의사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통해 지배층 엘리트들이 먼저 서양 음식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서양 상인들을 통해 일본에서 다양한 조미료가, 중국에서는 여러 종류의 술이 들어오기도 했다.
2. 5. 일제 강점기와 현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은 식량 공급을 위해 한반도의 농업 시스템을 통제했다. 소규모 농장을 통합하여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쌀 생산량을 늘려 일본 제국의 전쟁 수행을 지원했다. 반면 많은 한국인들은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조, 보리 등 다른 곡물 생산을 늘려야 했다.당시 식사는 계절과 형편에 따라 달랐다. 보통 추운 계절에는 하루 두 끼, 따뜻한 계절에는 세 끼를 먹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기에, 흰쌀밥은 1년에 한 번 구경하기 어려웠고 주로 값싼 잡곡으로 배를 채웠다. 반면 중산층과 상류층에게는 서양식 빵이나 미리 조리된 국수 같은 상업적으로 생산된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점령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끝났다.
해방 이후 한국 전쟁(1950–1953)과 냉전을 거치며 한반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남한)으로 분단되는 혼란을 겪었다. 이 시기에도 식량 부족은 계속되었으며, 미군 부대에서 나온 소시지나 스팸 같은 비교적 저렴한 재료를 넣어 끓인 ''부대찌개''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후 남북한의 역사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상업용 비료와 현대식 농업 장비 도입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점차 해소되기 시작했다. 즉석 식품과 가공 식품 소비가 늘고 식품의 질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축산업과 낙농업도 1970년대 상업적 낙농업과 기계화된 농장의 증가로 발전했다. 특히 육류 소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61년 3.6kg에서 1979년 11kg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불고기'' 전문 식당의 증가로 이어져 중산층도 비교적 쉽게 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육류 소비는 계속 증가하여 1997년에는 40kg에 달했고, 생선 소비량도 1998년 49.5kg을 기록했다.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인당 소비량이 1985년 128kg에서 1995년 106kg, 2003년 83kg으로 줄었다. 쌀 소비 감소와 함께 빵과 국수 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7700만달러 규모의 요리 외교 프로그램인 '세계로 가는 한국 음식' 사업을 시작하여 미국과 이슬람 국가 시장 등으로 진출을 모색했다.[9][10]

3. 특징
한국은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풍토를 가져 일찍이 신석기시대 이후 잡곡 농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벼농사가 전파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곡물은 한국 음식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삼국시대 후기부터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반찬을 부식으로 곁들이는 한국 고유의 일상식 형태가 형성되었다.



3. 1. 밥과 반찬
한국은 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풍토 덕분에 신석기시대 이후 잡곡 농사를 시작으로 농업이 발달했으며, 이후 벼농사가 전파되었다. 곡물은 한국 음식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삼국시대 후기부터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곁들이는 한국 고유의 일상식 형태가 자리 잡았다.한국인은 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하며, 일상식은 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는 형태이다. 주식인 밥은 쌀만으로 지은 쌀밥이나 조, 보리, 콩, 팥 등 잡곡을 섞어 지은 잡곡밥이 기본이다. 부식으로는 국이나 찌개, 김치와 장류가 기본이며, 육류, 어패류, 채소류, 해조류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반찬을 만든다. 이렇게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식사 방식은 여러 식품을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주식에는 밥 외에도 죽, 국수, 만두, 떡국, 수제비 등이 있으며, 부식으로는 국, 찌개, 구이, 전, 조림, 볶음, 편육, 나물, 생채, 젓갈, 포, 장아찌, 찜, 전골, 김치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일상 음식 외에 떡, 한과, 엿, 화채, 차, 술 등도 발달했으며, 저장 발효 식품인 장류, 젓갈, 김치 등도 다양하게 발달했다.
과거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어른을 중심으로 각자 개인용 그릇과 밥상을 사용하는 1인용 상차림이 발달했으나,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두레상에 둘러앉아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전통 상차림은 음식을 처음부터 상 위에 모두 차려놓는 공간 전개형 상차림을 원칙으로 한다. 뚜껑 있는 그릇인 '첩'에 담는 반찬 수에 따라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갖춘다. 주식과 부식이 분리된 이러한 상차림은 삼국시대 이후 하루 세 끼 식사의 기본 형태로 정착되었다. 때로는 점심에 국수장국으로 차린 면상(麵床)이나 비빔밥, 장국밥 같은 일품요리를 먹기도 하지만, 이는 별식(別食)으로 여겨진다.
밥상에서는 밥이 주식이고 반찬은 부식이므로, 반찬은 밥에 맞춰 선정된다. 반상차림은 식품의 배합, 간의 농담(濃淡), 음식의 냉온(冷溫), 색상의 배합 등 여러 면에서 합리성과 조화성을 이룬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 상차림을 '''반상'''이라고 한다. 반상은 주식인 밥과 부식인 반찬으로 이루어진 아침과 저녁 식단을 의미하며(점심은 점심이라 불리며, "마음에 점을 찍듯이" 죽이나 면으로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94]), 밥, 국 또는 찌개, 김치가 항상 오른다. 그 외 반찬의 수(첩)에 따라 삼첩, 오첩, 칠첩, 구첩, 십이첩반상으로 나뉜다('첩'은 뚜껑이 있는 반찬 그릇을 뜻한다).
왕의 수라상은 12첩반상이었다. 왕은 큰 원반(대원반)에 앉고, 곁에는 작은 원반(소원반)과 책상반이 놓였다. 대원반에는 흰밥(흰수라), 맑은 장국(곽탕), 장 3가지, 김치 3가지, 반찬 7가지, 생선뼈 등을 버리는 그릇(토구), 은수저와 은젓가락(은잎사시) 2벌이 놓였다. 수저 하나는 국용, 다른 하나는 동치미용이며, 젓가락 하나는 생선용, 다른 하나는 채소용이었다. 소원반에는 팥밥(팥수라), 전골 그릇(전골합), 찜, 반찬 두 가지, 찻주전자, 찻잔(차주발)과 쟁반, 빈 접시, 빈 공기, 그리고 수저 3벌이 놓였다. 팥수라는 왕이 흰밥 대신 먹고 싶을 때 바꾸는 것이었다. 수저 3벌은 음식을 미리 맛보는 기미상궁이 검식하거나 음식을 덜 때 사용했다. 식사가 끝나면 차주발에 차를 따라 쟁반에 받쳐 올렸다. 곁반인 책상반에는 곰탕, 조치(찌개류) 2가지, 전골냄비, 더운 구이가 놓였다. 팥수라를 먹을 때는 곽탕 대신 곰탕을 옮겨 놓았다.
반상을 바탕으로 식당 메뉴로 발달한 것이 한정식이다. 한정식이라는 명칭 자체는 오래된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각 지역 양반가의 상차림이 상품화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현대의 한 끼 식사는 한정식 상차림 규칙을 어느 정도 따르며, 주 메뉴(주로 국 종류)에 밥(흰쌀밥, 붉은 쌀이나 잡곡을 섞은 잡곡밥 등)과 김치, 나물 등 여러 종류의 반찬(밑반찬)으로 구성된다. 식당에서는 점심(경식)으로 간주되는 죽이나 면류 등에는 작은 상(소반)이 차려지며, 김치 등 밑반찬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요리의 반찬은 고유 명사인 '''반찬'''으로 불린다.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나물이나 김치 등 일부 반찬을 주문과 별도로 제공하며, 이러한 반찬은 다 먹지 못할 경우 남기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위생 문제가 제기되었고, 2009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으로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93]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 위치한 한반도는 남방의 벼농사 문화권과 북방의 잡곡 밭농사·목축 문화권의 경계에 있다. 흔히 쌀 위주 식문화로 생각되지만, 전통적으로 벼농사는 온난 습윤 기후 지역인 남서부 일부에 한정되었고[84], 북부 지역은 냉대 동계 소우 기후에 속해 조, 기장, 밀, 메밀, 수수 등 밭농사로 얻는 곡물을 주식으로 삼는 지역도 많았다[85]。
불교의 영향을 받은 일부 사람들은 정진 음식을 먹기도 한다. 또한 매 식사마다 다양한 종류의 반찬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3. 2. 종류
한국은 기후와 풍토가 농사에 적합하여 일찍이 신석기시대 후에 잡곡 농사로 농업이 시작되었고, 그 후 벼농사가 전파되었다. 이후 곡물은 한국 음식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삼국시대 후기부터 밥과 반찬으로 주식, 부식을 분리한 한국 고유의 일상식 형태가 형성되었다.밥, 죽, 떡, 국수, 수제비, 술 등의 곡물 음식이 발달하였고 콩으로 메주를 쑤어 장을 담그는 발효 음식도 발달하였다. 재배 채소뿐만 아니라, 산야에 자생하는 산나물, 들나물 등 채소의 종류가 다양하여 생채, 쌈, 나물, 김치로 만들어 식탁을 계절에 따라 변화있게 차릴 수 있었다. 예로부터 약식동원(藥食同原)이라는 관념에 따라 생강, 계피, 쑥, 오미자, 구기자, 더덕, 도라지, 율무, 모과, 석류, 유자, 인삼 등 약으로 쓰이는 재료가 음식의 조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삼계탕, 쑥떡, 생란, 더덕, 생채 등 여러 가지 음식과 생강차, 인삼차, 모과차, 유자차, 구기자차, 결명자차, 율무차 등의 차와 오미자 화채 등의 다양한 음료도 있다.
조미료와 향신료를 약념(藥念)이라 부르며 파, 마늘, 생강, 고추, 참기름, 깨소금 등이 약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국은 한국 음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문화와 달리, 한국 문화에서는 국은 식사의 시작이나 끝이 아니라, 밥과 함께 다른 반찬과 함께 곁들여지는 주요 구성 요소로 제공된다. 국은 종종 고기, 조개류, 채소로 만들어진다. 국보다 건더기가 많고 격식을 갖춘 것은 탕(湯)이라고 하며, 국물이 더 적고 진한 것은 찌개라고 한다.
몇 가지 인기 있는 국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맑은국: 간장으로 간을 한다. 소량의 오래 끓인 고기, 신선하거나 말린 해산물 또는 채소가 주요 재료가 될 수 있다.
- 된장국: 된장으로 간을 한다. 일반적인 재료로는 조개, 마른 멸치, 새우와 같은 해산물이 포함된다. 더 매운 맛을 위해 고추장을 첨가하기도 한다.
- 떡국: 얇게 썬 떡과 쇠고기 육수로 만드는 일반적인 떡국이다. 흰 떡은 백병(白餠) 또는 거모(擧摸)라고도 불렸다. 떡국은 쌀가루로 만든 길고 원통형 모양의 가래떡을 얇게 썰어 만든다. 닭 육수로 끓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꿩고기 국물로 끓였다고 전해진다 ("꿩 대신 닭"). 북한에는 떡을 공 모양으로 만드는 조랭이 떡국이 있다. 주로 음력 설날에 먹는데, 한국인들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 떡국 한 그릇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떡 모양이 옛 한국 동전인 엽전을 닮아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믿음도 있다.
- 곰국 또는 곰탕: 쇠고기 뼈나 연골을 끓여서 만든다. 서민 음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꼬리, 다리, 갈비뼈 등 쇠고기의 다양한 부위를 물에 끓여 지방, 골수, 젤라틴을 추출하여 풍부한 국물을 만든다. 쇠고기 머리와 내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금으로 간을 한다.
- 냉국: 여름철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먹는 차가운 국이다. 일반적으로 간장과 참기름으로 가볍게 양념한다.
- 신선로 (또는 구자탕): 숯을 태우는 굴뚝이 있는 특별한 요리 냄비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쇠고기, 생선, 달걀, 당근, 버섯, 양파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끓인다.[39]
- 미역국: 조선요리제법에 따르면 말린 미역으로 만들며, 일반적으로 미역을 쇠고기와 함께 볶아 물을 붓고 끓인다. 홍합을 넣기도 하며, 해안 지역에서는 쇠고기 대신 생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인의 생일, 특히 삼칠일(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 백일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돌잔치 (아기의 첫 번째 생일)에 주로 먹는다. 산모가 출산 후 미역을 먹는 한국 전통은 고구려에서 유래되었다.[40] '미역'이라는 단어 자체도 고구려에서 유래되었다.[41]
찌개는 종종 함께 먹는 반찬으로, 찌개를 요리하는 데 사용되는 유약을 바른 옹기 냄비(뚝배기)에 요리되어 제공된다. 가장 흔한 형태는 된장찌개이며, 채소, 해산물, 두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 계절과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도 흔하다.

한국 요리에서 면 또는 면 요리는 고유어 '국수' 또는 한자어 '면'으로 불린다. 고대부터 면을 먹었지만, 밀 생산량이 적어 밀가루 국수는 1945년까지 일상적인 음식이 되지 못했다.[48][49] 밀가루 국수(밀국수)는 길고 끊어지지 않는 모양 때문에 장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상징하여 생일,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다.[48]
한국 전통 면 요리에는 온면 또는 국수장국(뜨거운 맑은 국물), 냉면 (차가운 메밀국수), 비빔국수 (채소를 곁들인 차가운 면 요리), 칼국수 (칼로 썬 면), 콩국수 (차가운 콩 국물), 잡채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과 채소) 등이 있다. 궁중에서는 메밀국수와 꿩 국물로 만든 백면을 최고의 면 요리로 여겼다.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양지 국물을 섞은 시원한 냉면은 여름철 궁중 별미였다.[48]
- 자장면: 한국식 중국 요리 면 요리로, 매우 인기가 높다. 돼지고기나 해산물, 채소를 볶은 춘장을 넣어 만든다. 배달 음식으로도 인기가 많다.
- 라면: 라멘과 유사한 한국식 인스턴트 면을 가리킨다. 가게에서도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파는 경우가 많다.
- 잡채: 전통적으로는 여러 가지 채소를 볶아 만든 요리였으나, 현대에는 주로 당면과 채소, 버섯, 고기 등을 볶아 만든다. 결혼식,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즐겨 먹는다. 음식디미방(1670년경)에는 당면 없는 잡채 조리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규곤요람(1896년)에도 겨자 소스로 간을 한 당면 없는 잡채가 나온다. 1930년대 이후 당면을 넣은 잡채가 등장했으며, 고기나 해산물을 넣는 등 다양한 변형이 생겼다. 진주 지역의 향토 음식인 잡채는 문어, 가오리 등 해산물과 여러 채소를 간장과 참기름으로 무친 것이다. 다양한 재료 덕분에 영양가가 풍부하다.
한국 요리는 일본 요리나 중국 요리에 비해 배추, 숙주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산채를 사용한 요리가 많다. 특히 17세기에 일본을 거쳐 18세기 후반 조선 시대에 보급된 중남미 원산의 고추[86]는 현대 한국 요리에서 매운맛과 색깔을 내는 중요한 재료이다.
채소 소비량이 많으며, 이를 이용한 나물, 발효 식품인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 김치, 명란젓 등이 겨울철 저장 식품으로 각 가정에 상비되어 있다. 그 외에 생선 건어물, 젓갈, 식혜, 건조한 산채와 해초류도 만들어진다[87][88][89]
식물성 향신료 및 약념으로는 한국식 간장, 참기름, 마늘, 파, 생강, 고추 등이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향신료를 섞어 만든 양념을 사용한다. 수프류인 탕(湯)과 국이 발달했으며, 채소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기는 소, 닭, 돼지 및 그 내장을 사용한다.
한반도에는 누렁이라는 식용 개 품종이 존재하며,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먹기도 한다. 연간 소비량은 중국, 베트남[90]에 이어 많다는 통계가 있으나[91],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고기 섭취는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보신탕을 파는 가게는 100개 이하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92]。
한반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조류와 어패류 소비량이 많고, 생선회도 즐겨 먹는다. 조선 시대에는 일반 가정에서 고기보다는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한국에서는 그 비중이 달라졌다.
전통적인 한국 음식 상차림을 "'''반상'''"이라고 한다. "상"은 음식을 올려놓는 소반을 뜻하며, 반상은 아침과 저녁 식단으로 주식인 밥과 부식으로 이루어진다(점심은 점심이라 불리며, 죽이나 면으로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많았다).[94] 반상에는 밥, 국 또는 찌개, 김치가 항상 포함된다. 그 외 반찬의 수(첩, 뚜껑 있는 그릇)에 따라 삼첩, 오첩, 칠첩, 구첩, 십이첩 반상으로 나뉜다. 일반 가정에서는 삼첩이나 오첩 반상이 일반적이며, 칠첩, 구첩은 호화로운 상차림에 속한다. 십이첩은 과거 궁중에서만 차려지던 식단이었다.
반상을 바탕으로 식당 메뉴로 발달한 것이 한정식이다. 한정식이라는 명칭은 오래된 문헌에는 나오지 않으며, 각 지역 양반의 식단이 상품화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주요 음식 분류'''
- '''국, 탕, 찌개, 전골'''
- 감자탕: 돼지 등뼈와 감자 등을 넣고 끓인 전골 요리.
- 갈비탕: 쇠고기 갈비를 넣고 끓인 탕. 맑은 국물과 뽀얀 국물이 있다.
- 곰탕: 쇠고기 뼈 등을 고아 만든 뽀얀 국물. 소꼬리로 만들면 꼬리곰탕이라고 한다.
- 삼계탕: 어린 닭에 찹쌀, 인삼, 대추 등을 넣고 끓인 보양식.
- 설렁탕: 소의 고기, 뼈 등을 고아 만든 뽀얀 국물. 소금, 후추 등으로 간을 맞춰 먹는다.
- 육개장: 쇠고기와 여러 채소, 고사리나 숙주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국.
- 닭볶음탕: 닭고기와 감자 등 채소를 매콤하게 조린 요리.
- 추어탕: 미꾸라지를 갈거나 통째로 넣어 끓인 국.
- 도가니탕: 소의 슬개골과 주변 부위를 끓여 만든 탕.
- 내장탕: 소나 돼지의 내장과 채소를 넣고 끓인 탕.
- 보신탕: 개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전골 요리.
- 매운탕: 생선 뼈와 살, 채소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탕.
- 대구탕: 대구를 주재료로 끓인 탕.
- 알탕: 생선 알(주로 명란젓)을 넣고 매콤하게 끓인 탕.
- 시래기국: 말린 무청(시래기) 등을 넣고 끓인 국.
- 해장국: 숙취 해소를 위해 먹는 국의 총칭. 선지 해장국 등이 유명하다.
- 미역국: 미역을 주재료로 끓인 국.
- 김치찌개: 잘 익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두부 등을 넣고 끓인 찌개.
- 곱창전골: 소의 소장(곱창)과 채소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인 전골.
- 순두부찌개: 순두부를 주재료로 하여 얼큰하게 끓인 찌개.
- 참치찌개: 참치 통조림을 넣고 끓인 김치찌개.
- 된장찌개: 된장을 풀어 채소, 두부, 해산물 등을 넣고 끓인 찌개.
- 두부찌개: 두부를 주재료로 하여 끓인 찌개.
- 동태찌개: 냉동 명태(동태)를 넣고 얼큰하게 끓인 찌개.
- 부대찌개: 햄, 소시지, 라면 사리 등을 김치 국물에 넣고 끓인 찌개.
- 청국장찌개: 청국장을 풀어 채소, 두부 등을 넣고 끓인 찌개.
- 해물탕: 각종 생선, 조개, 새우 등 해물을 넣고 끓인 탕 또는 전골.
- '''고기 요리'''
- 갈비: 소나 돼지의 갈비 부위 또는 이를 이용한 구이. 양념하거나 소금구이로 먹는다.
- 삼겹살: 돼지 삼겹살 구이. 상추, 깻잎 등에 싸서 먹는다.
- 닭갈비: 닭고기를 채소와 함께 매운 양념에 볶거나 구워 먹는 요리.
- 닭한마리: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끓여 먹는 탕 또는 전골.
- 떡갈비: 다진 고기를 양념하여 떡 모양으로 만들어 구운 요리.
- 닭꼬치: 닭고기 조각과 채소를 꼬치에 꿰어 구운 요리.
-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는 요리.
- 쌈: 잎채소 등에 밥이나 고기 등을 싸서 먹는 방식.
- 보쌈: 삶아서 얇게 썬 돼지고기를 김치, 채소 등과 함께 쌈 싸 먹는 요리.
- 월남쌈: 라이스페이퍼에 채소, 고기 등을 싸 먹는 요리. 베트남 요리에서 유래했다.[103]
- 양념치킨: 튀긴 닭고기에 매콤달콤한 양념을 버무린 치킨.
- 육회: 양념한 생 쇠고기를 채 썬 배, 달걀 노른자 등과 함께 먹는 요리.
- 족발: 삶은 돼지족을 얇게 썰어 새우젓 등에 찍어 먹는 요리.
- '''해산물 요리'''
- 명란젓: 명태의 알집을 소금에 절여 숙성시킨 후 양념한 젓갈.
- 게장: 살아있는 꽃게를 간장이나 고추 양념에 절여 만든 음식.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있다.
- 산낙지: 살아있는 낙지를 잘게 썰어 참기름 등과 함께 먹는 요리.
- 조림: 생선(주로 고등어, 갈치 등)과 채소를 넣고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에 졸인 요리.
- 낙지볶음: 낙지를 채소와 함께 매콤하게 볶은 요리. 오징어로 만들면 오징어볶음.
- 회 (鱠): 생선이나 해산물을 날것으로 얇게 썰어 먹는 요리. 채소 등과 함께 무쳐 먹기도 한다.
- 홍어회 (洪魚鱠): 간재미과 생선을 삭혀 먹는 회. 특유의 암모니아 향이 특징이다.
- '''채소 및 기타 요리'''
- 김치: 배추, 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여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양념으로 버무려 발효시킨 음식. 겨울을 대비해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잡채: 당면과 여러 가지 채소, 버섯, 고기 등을 볶아 만든 요리.
- 나물: 채소나 산나물을 데치거나 볶아 양념에 무친 반찬.
- 전 (부침개, 지짐): 생선, 고기, 채소 등에 밀가루나 달걀 옷을 입혀 기름에 지진 요리. 파전, 김치전, 해물파전, 빈대떡(녹두 반죽) 등이 있다.
- 찜: 재료를 찌거나 양념과 함께 졸이는 요리.
- 계란찜: 달걀에 물이나 육수를 넣고 찐 요리.
- 아귀찜: 아귀와 콩나물 등을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찐 요리.
- 김밥: 밥과 여러 재료를 김으로 말아 썬 음식.
- 국밥: 국이나 탕에 밥을 말아 먹는 음식.
- 쌈밥: 밥과 쌈장을 잎채소에 싸서 먹는 음식.
- 죽: 쌀이나 다른 곡물을 물에 넣고 오래 끓여 만든 음식. 팥죽, 전복죽, 호박죽 등이 있다.
- 돌솥밥: 쌀, 잡곡, 콩 등을 돌솥에 넣어 지은 밥.
- 비빔밥: 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 고기, 달걀 등을 얹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비벼 먹는 음식. 뜨거운 돌솥에 담아내는 것은 돌솥비빔밥이다.[104]
- 볶음밥: 밥을 채소, 고기, 김치 등과 함께 기름에 볶은 음식.
- 냉면: 차갑게 먹는 국수 요리. 주로 메밀면을 사용하며, 시원한 육수에 말아 먹는 물냉면과 매콤한 양념에 비벼 먹는 비빔냉면이 있다.
- 쫄면: 굵고 쫄깃한 면발을 채소와 함께 매콤새콤한 양념에 비벼 먹는 음식. 인천에서 유래되었다.
- 국수: 밀가루 등으로 만든 면 요리의 총칭.
-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든 면을 육수에 끓인 음식.
- 콩국수: 삶은 콩을 갈아 만든 차가운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는 음식.
- 비빔국수: 삶은 국수를 매콤한 양념장에 비벼 먹는 음식.
- 수제비: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얇게 떼어 국물에 넣고 끓인 음식.
- 떡: 쌀이나 다른 곡물 가루를 쪄서 만든 음식. 떡 자체로 먹거나 요리에 넣어 먹는다.
- 떡볶이: 떡을 고추장 양념에 볶거나 끓인 음식. 대표적인 간식 메뉴이다.
- 만두: 밀가루 피에 다진 고기나 채소 소를 넣고 빚은 음식. 찌거나 굽거나 국(만두국)으로 끓여 먹는다.
- 튀김: 채소, 해산물, 만두 등을 기름에 튀긴 음식.
- 김: 김을 구워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한 반찬.
- 순대: 돼지 창자에 선지, 당면, 채소 등을 넣고 찐 음식.
- 젓갈: 생선 알, 내장, 살 등을 소금에 절여 삭힌 음식. 멸치젓, 새우젓 등이 있다.
- 번데기: 누에 번데기를 삶거나 조린 간식.
- 미숫가루: 여러 곡물을 찌거나 볶아 가루 낸 것을 물이나 우유에 타 마시는 음료.
- 묵: 메밀, 녹두, 도토리 등의 전분을 쑤어 굳힌 음식. 양념장에 찍어 먹거나 채소와 함께 무쳐 먹는다.
- 육수: 고기나 뼈를 삶아 우려낸 국물. 다양한 요리의 기본 국물로 사용된다.
3. 3. 발효 음식
밥, 죽, 떡, 국수, 수제비, 술 등의 곡물 음식과 함께 콩으로 메주를 쑤어 장을 담그는 발효 음식도 발달하였다.[87][88][89] 채소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으며, 이를 이용한 나물 외에도 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 장류, 김치, 젓갈(예: 명란젓) 등의 발효 식품이 겨울철 저장 식품으로 각 가정에 상비되어 왔다. 그 외에 생선 건어물, 식혜, 건조한 산채와 해초류도 만들어진다.[87][88][89]삼국 시대부터 발효 식품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백제는 차가운 음식과 ''김치''와 같은 발효 식품으로 유명했으며, 고구려 사람들 역시 발효에 능숙하여 발효 식품을 널리 섭취했다.[7]
주요 발효 음식은 다음과 같다.


- 김치: 소금(혹은 소금물)에 절인 채소(주로 배추, 무, 오이)에 생강, 마늘, 양파(김장김치에는 넣지 않는다)와 고춧가루 등을 넣고 발효시킨 음식이다.[42][43][44] 지역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반찬으로 제공되거나 수프, 밥 요리 등에 활용된다. 15세기 후반 문헌에는 겨울 동안 김치 항아리를 땅에 묻어 보관하는 풍습이 묘사되어 있다.[45] 전통적으로 장독대에 김치를 보관했으나, 김치냉장고의 보급과 상업적으로 생산된 김치의 등장으로 이러한 풍습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김치는 저칼로리, 저지방, 콜레스테롤이 없는 채소 기반 식품이며, 비타민 A, B, C, K와 칼슘, 철, 인,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하다.[46]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인들은 총 196만 5천 톤의 김치를 소비했으며, 1인당 하루 평균 88.3g을 섭취했다.[47]
- 된장: 삶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발효시킨 것이다.
- 고추장: 녹말(주로 찹쌀가루), 메줏가루, 소금, 고춧가루, 물을 적정 비율로 섞어 발효시킨 장이다. 18세기 후반 조선 시대에 고추가 보급되면서[86] 현재의 형태로 발전했다.
- 간장: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킨 후, 액체 부분만 떠낸 양념이다.
- 쌈장: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채소 등의 쌈 요리에 먹는 장이다.
- 젓갈: 생선, 조개, 생선 내장 등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식품이다. 명란젓 등이 있다.
이러한 발효 음식들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독특한 풍미와 영양을 제공한다.
3. 4. 약념
한국 요리에서 조미료와 향신료는 단순히 맛을 내는 것을 넘어 '약념(藥念)'이라고 불리며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약식동원(藥食同原)의 전통적인 생각과 관련이 깊으며, 생강, 계피, 쑥, 오미자, 구기자, 더덕, 도라지, 인삼 등 약재로 쓰이는 재료가 음식 조리에 많이 활용되는 배경이 된다.주로 사용되는 약념으로는 파, 마늘, 생강, 고추, 참기름, 깨소금 등이 있으며, 이 재료들이 음식의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여겨졌다. 이 외에도 발효되지 않은 조미료나 향신료로서 고춧가루, 후추, 초피, 겨자, 겨자과, 양파, 부추 등 다양한 재료가 약념으로 쓰인다.[26] 다양한 향신료를 섞어 만든 혼합 조미료인 양념 역시 '약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5. 식사 형태와 예절
한국인은 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하며, 일상식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형태이다. 주식은 쌀만으로 지은 쌀밥이나 조, 보리, 콩, 팥 등의 잡곡을 섞어 지은 잡곡밥이 기본이다. 부식으로는 국이나 찌개, 김치와 장류를 기본으로 하며, 육류, 어패류, 채소류, 해조류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반찬을 만든다. 이렇게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식사 형태는 여러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방식이다.[73]주식으로는 밥 외에도 죽, 국수, 만두, 떡국, 수제비 등이 있으며, 부식으로는 국, 찌개, 구이, 전, 조림, 볶음, 편육, 나물, 생채, 젓갈, 포, 장아찌, 찜, 전골, 김치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일상 음식 외에도 떡, 한과, 엿, 화채, 차, 술 등도 발달하였다. 특히 장류, 젓갈, 김치와 같은 저장 발효 식품이 다양하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 식사 예절 ===
식사 예절은 지역이나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현대에는 일부 엄격했던 규범들이 완화되거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인 식사 예절은 다음과 같다.
-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아랫사람이 들도록 한다.
-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 손에 함께 들지 않으며,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숟가락을 상 위에 놓는다.
- 수저를 그릇에 걸치거나 얹어 놓지 않는다.
-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는다. 이는 중국 요리나 일본 요리와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각자에게 수저(숟가락과 젓가락)가 주어지며, 숟가락으로 밥과 국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74] 다만, 숭늉이나 냉면 국물을 마실 때는 그릇을 들어도 괜찮다는 견해도 있다.
- 식사를 시작할 때는 국이나 김칫국물을 먼저 숟가락으로 떠 마신 후,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먹는다. 밥과 국물이 있는 음식(김치, 찌개, 국)은 숟가락으로, 국물 없는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는다.
-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수저로 반찬이나 밥을 뒤적거리지 않으며, 특정 음식만 골라내거나 양념을 털어내고 먹지 않는다.
- 여럿이 함께 먹는 음식은 각자의 접시에 덜어 먹는 것이 위생적이다. 초장이나 초고추장 등도 개인 접시에 덜어 찍어 먹는다.
- 먹는 도중 입안에 넘기지 못하는 뼈나 생선 가시 등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조용히 종이에 싸서 버린다. 상 위나 바닥에 그대로 버리지 않는다.
- 식사 중에는 입안에 음식물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경우,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손이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다.
- 식사 속도는 다른 사람들과 맞추도록 노력하며, 특히 어른과 함께 식사할 때는 어른이 수저를 내려놓은 후에 따라 내려놓는다.
- 식사를 마친 후에는 수저를 처음 위치에 가지런히 놓고, 사용한 휴지는 대강 접어 상 위에 둔다.
- 이쑤시개를 사용할 때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
- 숟가락을 밥 위에 수직으로 꽂는 행위는 제사를 연상시키므로 피한다.
- 더운 음식을 입으로 불어 식힐 때는 입김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식탁 위에 팔꿈치를 괴거나 손을 올리지 않는다.
- 식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거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트림을 하는 것은 실례이다.
이러한 식사 예절은 조선 시대의 유교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75년 이덕무가 저술한 『사소절』(士小節)에는 당시의 식사 예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할 때 냄새나거나 더러운 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 "식사할 때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리 먹지 말라", "수저를 던지거나 그릇에 부딪혀 소리를 내지 말라" 등은 예의 바른 식사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이다.[73]
과거에는 식탁에서 가장 연장자인 남성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고, 여성들은 남성들이 식사를 마친 후 다른 공간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식사 중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조용한 분위기였다. 현대에는 이러한 관습이 많이 완화되어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식탁의 젊은 구성원은 연장자나 손님보다 먼저 수저를 들거나 식사를 시작하지 않으며, 연장자나 손님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 먼저 자리를 뜨지 않는 예절은 남아있다.[74]
식탁에서 웃어른 앞에서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마시는 것이 예의이다. 술을 따르거나 받을 때는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나 가슴 부근을 가볍게 받치는 자세를 취한다.[97] 조선 시대에 정립된 향음주례(鄕飮酒禮)에 따르면, 손님은 주인이 처음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는 주인이 세 번 권했을 때 비로소 받는 것이 겸양의 표현이었다.[75] 식사 중 흡연은 웃어른 앞에서는 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상차림 ===
전통적인 한국 음식 상차림을 '''반상'''(飯床)이라고 한다. 반상은 주식인 밥과 함께 국이나 찌개,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으로 구성된다.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듯이'라는 의미의 점심이라 불리며, 죽이나 면 등으로 간단히 먹는 경우가 많았다.[94] 반찬의 가짓수에 따라 첩(楪, 뚜껑 있는 반찬 그릇)을 단위로 하여 삼첩, 오첩, 칠첩, 구첩, 십이첩 반상으로 구분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삼첩이나 오첩 반상을 차렸으며, 칠첩이나 구첩은 상당히 격식 있는 상차림에 해당한다. 십이첩 반상은 과거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던 수라상이었다.
이러한 반상을 바탕으로 식당 메뉴로 발전한 것이 한정식이다. 한정식이라는 명칭 자체는 오래된 문헌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각 지역 양반가의 상차림이 상품화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식탁을 차릴 때는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사람의 왼쪽에 밥그릇, 오른쪽에 국그릇을 놓고, 숟가락과 젓가락은 국그릇 오른쪽에 세로로 놓는다. 뜨거운 음식은 식탁 오른편에, 차가운 음식은 왼편에 놓는 경향이 있다. 채소 반찬은 밥과 함께 왼쪽에, 김치는 뒤쪽에, 간장 등 소스는 앞쪽에 놓는다.
한국 요리의 밑반찬은 고유 명사인 '''반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주문한 주요리 외에 김치나 나물 등 여러 가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제공된 반찬을 남기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일부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적되면서 위생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행위는 2009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해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93]
=== 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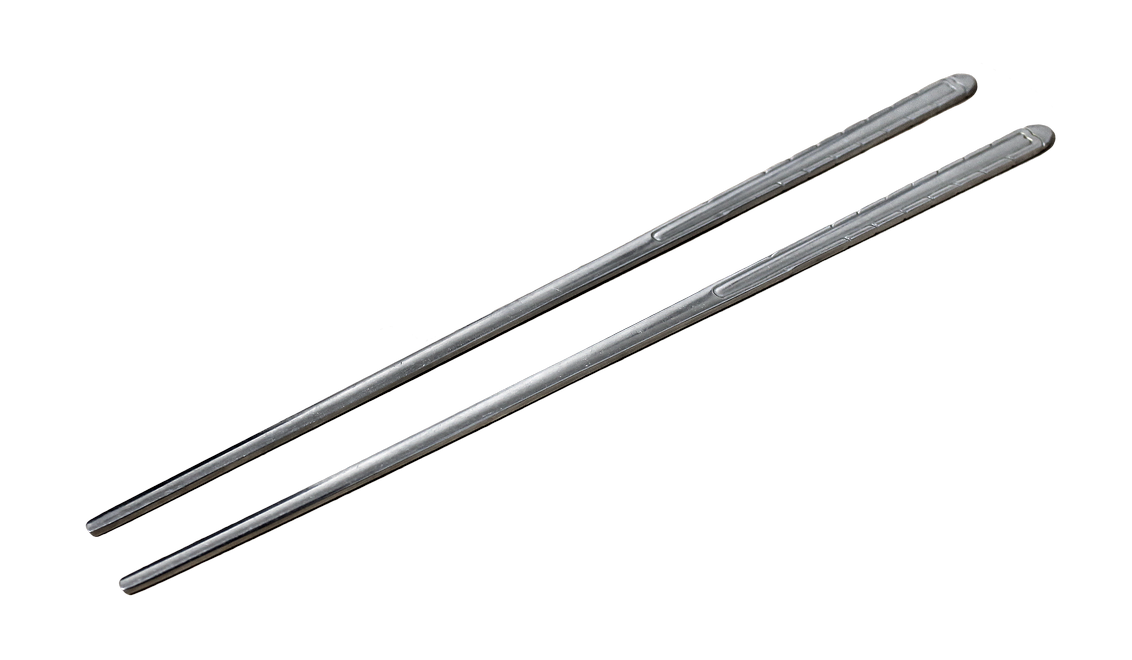
식사에는 주로 금속(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며, 이 둘을 합쳐 수저라고 부른다. 과거 왕족이나 양반들은 신분을 나타내거나 독살을 방지하기 위해 은이나 놋쇠로 만든 식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은은 독 성분인 비소에 닿으면 색이 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 받침은 수저받침이라고 한다. 젓가락을 그릇 위에 걸쳐 놓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만, 식사 중에는 숟가락을 그릇 안에 넣어두거나 그릇 가장자리에 걸쳐 놓기도 한다.
밥을 담는 스테인리스 그릇은 흔히 "공깃밥" 그릇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6년에 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작은 규격의 스테인리스 밥그릇 사용을 의무화했던 정책의 흔적이다.[95][96] 당시 규격은 지름 10.5cm, 높이 6cm였으나, 현재 이 규제는 폐지되었다. 금속 식기는 열전도율이 높아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손으로 들고 먹기 어렵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식기를 내려놓고 먹는 식사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국밥)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닥에 앉아 식사할 경우,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 것이 전통적인 좌법 중 하나로 여겨졌다.
4. 음식의 종류


한국 음식은 곡류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과, 곡류 외의 각종 식품으로 만드는 반찬, 후식이나 간식으로 떡과 한과가 있으며, 음료로서 차와 화채 등이 있다. 주식으로는 주로 밥을 먹으며, 죽이나 국수 등도 있다. 반찬은 국이나 찌개, 김치를 기본으로 하며,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조리법이 발달하였다.
고대에는 사냥과 어업으로 고기를 얻었으며, 삼국 시대부터 가축 사육이 시작되었다. 쇠고기는 귀하게 여겨졌으나, 소가 중요한 역축이었기에 일상적으로 먹기보다는 돼지고기나 해산물을 더 자주 섭취했다. 닭고기 역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었다.[29] 돼지고기는 고대부터 꾸준히 식용되었으며, 특히 삼겹살 구이는 오늘날 매우 인기 있는 메뉴이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생선과 조개류 등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다. 생선은 날것(회)으로 먹거나 굽고, 찌고, 말려서 먹으며, 젓갈로 만들어 저장하기도 한다. 조개류 역시 국물을 내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31]
한국 요리에는 무, 배추, 콩나물, 시금치, 버섯, 해조류 등 매우 다양한 채소가 사용된다. 채소는 생으로 무치거나(생채), 데치거나 볶아서 나물(숙채)로 만들어 먹으며, 국, 찌개, 볶음 등 여러 요리에 들어간다.[34][35]
국과 찌개는 밥과 함께 먹는 중요한 음식이다. 국은 맑은 국, 된장을 이용한 국, 뼈를 오래 고아 만든 국, 차게 먹는 냉국 등 다양하다. 찌개는 국보다 국물이 적고 간이 센 편으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대표적이다.
면 요리 역시 한국 음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뜨겁거나 차가운 국물에 말아 먹는 국수, 비벼 먹는 국수, 잡채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48]
반찬으로는 재료를 불에 굽는 구이, 양념과 함께 찌거나 삶는 찜, 익히지 않은 회, 기름에 지지는 전, 데치거나 볶아 양념하는 나물 등이 있다.
많은 한국의 반찬은 발효를 통해 독특한 풍미를 내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정 지역은 고유한 음식으로 유명하며, 예를 들어 전주는 비빔밥, 수원은 갈비가 잘 알려져 있다.
4. 1. 주식
한국은 기후와 풍토가 농사에 적합하여 일찍이 신석기시대 이후 잡곡 농사를 시작으로 농업이 발달했으며, 이후 벼농사가 전파되었다. 곡물은 한국 음식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삼국시대 후기부터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반찬을 부식으로 하는 한국 고유의 일상식 형태가 형성되었다. 한국인은 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며, 일상식은 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형태이다. 주식은 쌀만으로 지은 쌀밥과 조, 보리, 콩, 팥 등의 잡곡을 섞어 지은 잡곡밥을 기본으로 한다. 부식으로는 국이나 찌개, 김치와 장류를 기본으로 하며, 육류, 어패류, 채소류, 해조류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반찬을 만든다. 이처럼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식사 형태는 여러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여 영양적으로 합리적이다.주식의 종류로는 밥, 죽, 국수, 만두, 떡국, 수제비 등이 있다.

밥은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주식으로,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 백미밥: 껍질을 벗겨낸 백미로 지은 밥이다. 매우 하얗고 식감이 부드러워 과거에는 아침상에 주로 올랐으나, 현재는 끼니에 상관없이 먹는다.
- 현미밥: 껍질을 벗기지 않은 현미와 백미를 섞어 지은 밥이다. 쌀의 영양소는 대부분 껍질에 있어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가가 높다. 또한 소화 시간이 길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식감이 다소 딱딱하다.
- 흑미밥: 검은쌀(흑미)을 넣어 지은 밥이다. 식감은 백미와 비슷하며 건강에 좋다.
- 잡곡밥: 여러 가지 곡물(주로 콩, 조, 기장 등)과 백미, 현미를 섞어 지은 밥이다.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여 건강식이나 다이어트식으로 널리 이용된다.
- 보리밥: 보리를 현미나 백미와 섞어 지은 밥이다. 보리는 생산량이 많고 수확 시기가 빨라 예로부터 주요 곡식으로 애용되었다. 과거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보리가 수확되기까지의 힘든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부르기도 했다.
- 약밥: 특별한 날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찹쌀밥에 밤, 대추 등 다양한 견과류와 과일을 넣어 찐 밥이다.
- 돌솥밥: 쌀을 곡물이나 콩과 함께 돌솥에 지은 밥으로, 반찬과 함께 제공된다.
- 비빔밥: 밥에 여러 가지 나물, 고기, 계란 등을 넣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비벼 먹는 음식이다. 돌솥에 담아 나오는 것은 돌솥비빔밥이라고 한다.[104]
- 김밥: 밥과 다양한 재료를 김으로 말아 만든 음식이다. 흔히 소풍이나 간편식으로 즐겨 먹는다.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은 주먹밥의 일종인 "삼각김밥"이라고 한다.
- 국밥: 밥을 뜨거운 국에 말아 먹는 음식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 쌈밥: 밥에 쌈장을 얹어 상추 등 잎채소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곡물은 한국 식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한국의 여러 건국 신화에서도 곡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어머니가 보낸 비둘기로부터 보리 씨앗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11] 제주도의 세 창건 신은 탐라의 공주들과 결혼할 때 다섯 가지 곡물 씨앗을 가져와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신화도 전해진다.[12]
근대 이전에는 보리와 기장이 주요 주식이었고, 밀, 수수, 메밀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쌀은 본래 한반도 고유 작물이 아니었으며, 쌀 재배 이전에는 기장이 주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쌀은 삼국 시대, 특히 남부의 신라와 백제에서 중요한 곡물로 자리 잡았다. 신라에서는 쌀이 세금을 내는 주요 품목이었으며, 세금을 뜻하는 한자어에는 벼를 나타내는 글자가 포함되기도 했다. 쌀에 대한 선호는 조선 시대로 이어져 새로운 재배법과 품종 개발로 생산량이 증가했다.
쌀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다른 곡물과 섞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오늘날의 ''보리밥''이나 ''콩밥''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이다.[13] 쌀겨를 제거한 백미는 도입 이후 가장 선호되는 형태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밥은 솥한국어 또는 무쇠솥한국어이라는 무쇠 솥에 지었다. 이 방식은 최소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신라 시대 무덤에서도 유사한 솥이 발견되었다. 솥한국어은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쌀은 밥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가루로 만들어 200가지가 넘는 떡을 만들거나, 죽 또는 미음으로 끓여 다른 재료와 섞어 먹기도 한다. 또한, 쌀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약주(전통 술)를 빚는다. 곡물 가루로 만든 음료인 미수나 미숫가루는 오랫동안 식사 대용이나 보충제로 이용되어 왔다.[14]

콩류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작물이었으며,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된 오래된 콩 유물이 이를 증명한다.[16][17] 경상남도 진주 옥방 유적지에서는 기원전 1000년~900년경에 콩이 식량 작물로 재배되었음이 확인되었다.[18] 콩은 오늘날 두부로 만들어지거나, 싹을 틔워 콩나물로 만들어 볶아 먹기도 한다. 통째로 양념하여 반찬으로 먹거나, 갈아서 두유를 만들어 콩국수의 국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두유를 만들고 남은 ''비지''는 찌개나 죽을 걸쭉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 콩은 다른 곡물과 함께 ''콩밥''으로 먹기도 하며,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등 발효 조미료인 ''장''의 주재료로 사용된다.[19][20]

녹두도 흔히 사용된다. 녹두 싹인 ''숙주 나물''은 데쳐서 참기름, 마늘, 소금으로 양념하여 반찬으로 먹는다. 녹두를 갈아 만든 ''녹두죽''은 소화가 잘 되어 환자식으로 이용된다.[21] 간 녹두와 숙주 나물로 만드는 ''빈대떡''은 인기 있는 간식 및 안주이다. 녹두에서 추출한 녹말로는 투명한 당면을 만든다. 당면은 ''잡채''나 ''순대''의 주재료이며, 국이나 찌개에 부재료로 들어가기도 한다.[22] 녹두 녹말은 묵 형태인 ''녹두묵''이나 ''황포묵''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맛이 순한 ''묵''은 간장, 참기름, 김 등으로 양념하여 먹거나, 채소와 함께 무쳐 ''탕평채''로 만들기도 한다.[23]
팥의 재배 역시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함경북도 회령 오동 유적지에서 무문 시대(기원전 약 1500~300년)의 팥이 발견되었다. 팥은 밥에 섞어 ''팥밥''으로 먹거나, 떡이나 빵의 소 또는 고명으로 사용된다. 팥으로 쑨 죽인 ''팥죽''은 겨울철, 특히 동지에 즐겨 먹는다. 동지에는 찹쌀가루로 만든 새알심한국어이 들어간 ''동지 팥죽''을 먹는데, 예로부터 팥죽이 악귀를 쫓는 힘이 있다고 믿었다.[24][25]
죽은 밥 외의 주식 형태로, 아침 식사나 환자식, 또는 연회의 전채 요리로 제공된다. 한국의 죽은 쌀알 형태가 거의 남지 않도록 푹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 팥죽: 팥을 끓여 만든 죽으로, 새알심한국어을 넣어 먹기도 한다.
- 전복죽: 전복과 전복 내장(게우한국어)을 넣어 끓인 영양죽이다.
- 호박죽: 호박을 주재료로 하여 달콤하게 끓인 죽이다.
- 녹두죽: 녹두를 갈아 끓인 죽으로, 소화가 잘 된다.
면 요리는 한국어로 '국수' 또는 한자로 '면'이라고 한다. 고대부터 면을 먹었지만, 밀 생산량이 적어 밀가루 국수는 1945년 이후에야 대중화되었다.[48][49] 길고 끊어지지 않는 면의 모양 때문에 장수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하는 의미로 생일, 결혼식 등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다.[48]
한국의 전통 면 요리로는 따뜻한 국물의 온면(국수장국), 차가운 메밀국수인 냉면, 채소를 곁들인 비빔국수, 칼로 썬 면인 칼국수, 차가운 콩 국물의 콩국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과 채소를 볶은 잡채 등이 있다. 궁중에서는 메밀국수에 꿩 육수를 사용한 백면을 최고로 여겼고, 여름에는 동치미 국물과 쇠고기 육수를 섞은 냉면을 즐겨 먹었다.[48]
- 냉면: 차갑게 먹는 국수로, 크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으로 나뉜다.
- 평양냉면: 메밀을 주재료로 한 면에 맑은 쇠고기 육수나 동치미 국물을 부어 만든다. 한국 전쟁 이후 남한에서 널리 퍼진 물냉면은 주로 평양식을 가리킨다. 맵거나 짜지 않은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 함흥냉면: 고구마나 감자 전분으로 만든 질긴 면에 매운 양념장과 회(주로 가자미나 홍어)를 얹어 비벼 먹는 회냉면이 대표적이다. 과거 함경도에서는 참가자미를 사용했으나 남한에서는 홍어를 주로 사용한다. 홍어는 껍질을 벗겨 잘게 썰어 식초에 재웠다가 간장으로 버무린 후, 냉면에 얹기 직전에 양념으로 무친다. 면은 겨울에는 전분만으로, 여름에는 밀가루를 섞어 만들기도 한다.
- 자장면: 한국식으로 변형된 중국 요리 면 요리로, 볶은 춘장 소스를 면 위에 부어 비벼 먹는다. 돼지고기나 해산물, 채소 등이 들어가며,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배달 음식이자 간편식이다.
- 쫄면: 인천에서 유래한 분식 메뉴로, 매우 질기고 탄력 있는 면발에 매콤새콤한 양념과 채소를 비벼 먹는다.
- 국수: 일반적으로 밀가루로 만든 면 요리를 통칭하기도 한다.
- 칼국수: 밀가루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든 면을 해물이나 고기 육수에 끓여 먹는 따뜻한 국수이다.
- 콩국수: 삶은 콩을 갈아 만든 차가운 콩 국물에 면을 말아 먹는 여름철 별미이다.
- 비빔국수: 삶은 국수에 고추장 기반의 매콤한 양념장과 채소를 넣고 비벼 먹는 차가운 국수이다.
- 잡채: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당면을 삶아 간장 양념에 버무리고, 여러 가지 채소와 버섯, 고기 등을 볶아 함께 섞은 요리이다. 잔치나 명절에 빠지지 않는 전통 음식이다. 과거에는 당면 없이 채소만으로 만들었으나, 1930년대 이후 당면을 넣는 조리법이 일반화되었다.
- 라면: 일본의 라멘에서 유래한 한국식 인스턴트 면 요리이다. 다양한 종류의 맛과 형태가 있으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대중적으로 소비된다.
- 짬뽕: 자장면과 함께 대표적인 한국식 중국 요리이다. 해물과 채소를 볶아 고춧가루를 넣은 얼큰한 국물에 면을 넣어 끓인다.
이 외에도 돼지고기, 두부, 채소 등을 넣어 빚은 만두는 굽거나 쪄서 먹기도 하고, 쇠고기 국물 등에 넣어 끓인 만둣국으로 즐겨 먹는다. 특히 겨울철이나 설날에 많이 먹는다. 떡국은 가래떡을 얇게 썰어 맑은 장국에 끓인 음식으로, 주로 설날 아침에 먹는다. 수제비는 밀가루 반죽을 얇게 떼어 내어 멸치나 해물 육수에 채소와 함께 끓여 먹는 음식이다.
4. 2. 부식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사는 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형태이다. 이때 주식인 밥과 함께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을 '''부식''' 또는 '''반찬'''이라고 부른다. 부식은 국이나 찌개, 김치와 장류를 기본으로 하며, 육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만든다. 밥과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는 식사 형태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합리적인 방식이다.부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 찌개, 구이, 전, 조림, 볶음, 편육, 나물, 생채, 젓갈, 포, 장아찌, 찜, 전골, 김치 등이 있다.
'''국과 탕'''

국은 밥과 함께 거의 항상 상에 오르는 음식으로, 물에 주재료와 함께 국물을 내는 재료를 넣고 끓여 만든다. 탕(湯)은 국보다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간 음식을 의미하며, 종종 주 요리로 취급되기도 한다.
- 미역국: 멸치와 다시마 등으로 국물을 내고 미역을 넣어 끓인다. 주로 산모가 출산 전후에 많이 먹으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소고기나 굴 등을 넣어 끓이기도 한다.
- 콩나물국: 콩나물을 주재료로 끓인 맑은 국으로, 주로 아침 식사나 해장용으로 즐겨 먹는다.
- 된장국: 멸치나 다시마로 낸 국물에 된장을 풀어 맛을 낸 국이다. 다양한 채소를 넣어 끓인다.
- 무국 (또는 뭇국): 쇠고기 국물에 무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끓인 시원한 맛의 국이다.
- 김치찌개: 김치를 주재료로 하여 돼지고기나 참치 등을 넣고 끓인 얼큰한 찌개이다.
- 갈비탕: 소의 갈비와 채소, 때로는 몸에 좋은 약재를 함께 넣고 끓여낸다.
- 삼계탕: 어린 닭의 뱃속에 찹쌀, 인삼, 대추 등을 채워 넣고 푹 끓인 보양식이다. 특히 더운 여름철 복날에 즐겨 먹는다.
- 기타 국과 탕: 아욱국, 감자탕, 곰탕, 설렁탕, 육개장, 추어탕, 해물탕, 매운탕, 알탕, 닭볶음탕, 보신탕, 도가니탕, 해장국 등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김치'''
김치는 배추, 무, 오이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인 후,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다양한 양념과 부재료를 넣어 발효시킨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지역과 계절, 재료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김치가 있으며, 기본적인 반찬일 뿐 아니라 찌개, 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활용된다.
과거에는 겨울 동안 채소를 먹기 위해 김치를 담가 땅속 장독대에 묻어 보관했으며, 이렇게 김치를 담그는 행위를 김장이라고 한다.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45] 김치는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이며 비타민 A, 비타민 C, 유산균 등이 풍부하다.[46]
'''나물, 생채, 잡채'''
나물은 채소나 산나물을 데치거나 볶아 양념한 반찬을 말한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며, 주로 간장, 참기름, 깨소금, 마늘 등으로 맛을 낸다(숙채). 반면, 채소를 익히지 않고 식초, 고춧가루 등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친 것은 생채라고 한다. 잡채는 삶은 당면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볶아 간장 양념으로 버무린 음식으로, 잔치나 명절에 빠지지 않는 요리 중 하나이다.
'''구이'''

구이는 고기, 생선, 채소 등을 불에 직접 구워 먹는 조리법이다. 특히 고기 구이는 식탁 중앙에 숯불이나 불판을 놓고 즉석에서 구워 먹는 경우가 많다. 구운 고기는 상추나 깻잎과 같은 쌈 채소에 밥, 마늘, 쌈장 등과 함께 싸서 먹는다.
- 불고기: 얇게 썬 쇠고기를 간장 양념에 재워 구워 먹는 대표적인 한국 요리이다.
- 삼겹살: 돼지고기의 삼겹살 부위를 구워 먹는 것으로, 한국인이 가장 즐겨 먹는 구이 요리 중 하나이다.
- 갈비: 소갈비나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워 굽거나 양념 없이 소금구이로 먹는다.
- 기타: 닭갈비, 떡갈비, 닭꼬치, 돼지 껍데기 구이, 장어구이, 고등어구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구이 요리가 있다.
'''전과 부침개'''
전(또는 부침개)은 얇게 썬 재료에 밀가루나 달걀 옷을 입혀 기름에 지진 음식, 또는 밀가루 반죽에 여러 재료를 섞어 얇게 부친 음식을 통칭한다. 파전, 김치전, 해물파전, 빈대떡, 육원전(동그랑땡) 등이 있으며, 주로 간장 양념에 찍어 먹는다. 명절 음식이나 막걸리와 함께 즐겨 먹는 안주로 인기가 높다. 화전은 찹쌀가루 반죽 위에 진달래꽃 등 식용 꽃을 얹어 지진 달콤한 전이다.
'''찜과 선'''
찜은 주재료를 양념과 함께 오래도록 찌거나 삶아 만든 요리이다. 갈비찜, 안동찜닭, 아귀찜 등이 대표적이다. 선은 주로 채소의 속을 파내고 소를 채워 찐 음식을 말한다.
'''회'''
회는 익히지 않은 날 재료를 이용한 음식으로, 주로 싱싱한 생선이나 해산물을 얇게 썰어 초고추장이나 간장과 와사비에 찍어 먹는다. 광어, 우럭, 오징어, 굴, 멍게 등이 흔히 사용된다. 육회는 신선한 쇠고기를 얇게 채 썰어 간장, 참기름, 배 등으로 양념한 것이며, 산낙지는 살아있는 낙지를 잘라 참기름과 소금을 곁들여 먹는 독특한 음식이다. 홍어회는 삭힌 홍어를 먹는 것으로, 특유의 강한 암모니아 향이 특징이다.
'''조림과 볶음'''
조림은 주재료를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과 함께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졸여 만든 반찬이다. 생선조림(고등어, 갈치 등), 두부조림, 장조림, 연근조림 등이 있다. 볶음은 재료를 기름에 볶다가 양념을 넣어 만든 요리로, 제육볶음, 오징어볶음, 낙지볶음, 멸치볶음 등이 있다.
'''젓갈과 장아찌'''
젓갈은 생선, 새우, 조개, 생선알 등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저장 음식이다. 밥반찬으로 먹거나 김치를 담그는 데 중요한 부재료로 사용된다. 새우젓, 멸치젓, 명란젓, 창난젓, 어리굴젓 등이 있으며, 게장은 살아있는 게를 간장이나 고추장 양념에 절여 만든 별미이다. 장아찌는 무, 오이, 마늘, 깻잎 등을 간장, 된장, 고추장에 담가 오래 두고 먹는 저장 반찬이다.
'''반찬 문화'''
반찬은 한국 식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한식 식당에서는 주 요리를 주문하면 김치, 나물 등 여러 가지 기본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는 문제가 위생상의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며, 이는 2009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금지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식당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93]
'''안주'''

안주는 술을 마실 때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칭한다. 소주, 막걸리, 맥주 등 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안주가 있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 요리가 안주로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안주로는 파전, 두부김치, 삶은 오징어, 골뱅이무침, 족발, 보쌈, 치킨, 삼겹살 구이, 땅콩, 어묵, 소라, 낙지 등이 있다.
4. 3. 후식 및 간식
재료를 기름에 튀긴 '''튀각'''과 '''부각'''은 간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부각은 재료에 찹쌀 풀칠을 하여 필요할 때 튀겨 먹으며, 밑반찬으로도 많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김부각이 있다. '''포'''는 육포와 어포로 나뉘며, 술안주나 간식, 밑반찬으로 이용된다.
'''떡'''은 명절이나 큰 행사에 자주 등장하는 음식이다. 고조선 시대의 시루 유물이 발견되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치는 떡, 빚는 떡, 찌는 떡으로 나뉜다. 찧은 쌀(메떡)이나 찧은 찹쌀(찰떡), 또는 통찹쌀로 만들며, 단팥소, 으깬 붉은 콩, 건포도, 깨, 단호박, 콩, 대추, 잣, 꿀 등으로 만든 달콤한 소를 채우거나 덮어서 먹는다. 보통 디저트나 간식으로 제공된다. 백설기, 송편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송편''은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석에 주로 먹는 떡의 일종이다. 17세기 문헌인 『요록(要錄)』에는 "흰 쌀가루로 떡을 만들어 솔잎과 함께 쪄서 물에 씻어낸다"는 기록이 있다. 초기에는 흰 쌀가루만 사용했고, 솔잎 향을 입혀 먹었다.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팥, 잣, 호두, 생강, 계피 등을 소로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의 떡, 한과, 음청류』에 따르면, 강원도, 충청도 등 산간 지역에서는 감자송편, 도토리송편, 송기송편을, 함경도, 평안도, 경기도 등 해안 지역에서는 조개송편을, 전라도, 경상도 등 남부 지방에서는 쑥잎을 넣은 송편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꿀이나 달콤한 참깨, 검은콩 등 부드러운 단 재료를 소로 사용하며, 찌는 과정에서 솔잎으로 풍미를 더하기도 한다.[58] ''약식''(약밥)은 찹쌀에 밤, 잣, 대추 등을 넣어 만든 달콤한 떡이며, ''찹쌀떡''은 단팥소로 속을 채운 떡이다.

한국의 전통 과자를 통틀어 '''한과'''라고 한다. 한과의 재료는 주로 곡물 가루, 꿀, ''엿'', 설탕, 과일, 식용 뿌리 등이다. 한과는 크게 ''유밀과''(기름에 튀긴 과자), ''숙실과'', ''정과'', ''과편'', ''다식''(차와 함께 먹는 과자), ''엿''으로 나뉜다.
- ''유밀과''는 반죽 조각을 볶거나 튀겨서 만드는데, ''매작과''와 ''약과''가 대표적이다. ''매작과''는 밀가루, 식물성 기름, 계피, 생강 즙, ''조청'', 잣으로 만든 고리 모양 과자이다. ''약과''는 이름 그대로 '약이 되는 과자'라는 뜻으로, 꿀, 참기름, 밀가루로 만든 꽃 모양의 비스킷이다. ''유과''와 약과는 추석, 결혼식, 환갑 잔치 등 특별한 날에 즐겨 먹는 전통 디저트이다.
- ''숙실과''는 과일, 생강, 견과류 등을 물에 끓인 후 원래 모양이나 다른 모양으로 빚어 만든다.
- ''과편''은 신맛 나는 과일, 전분, 설탕을 함께 끓여 만든 젤리 같은 과자이다.
- ''다식''은 '차와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쌀가루, 꿀, 견과류, 약초, 참깨, 대추 등 다양한 가루를 반죽하여 모양을 낸다.
- ''정과''는 과일, 식물 뿌리, 씨앗 등을 꿀, 물엿, 설탕에 졸여 만든 것으로, 마멀레이드나 잼/젤리와 비슷하다.[59][60][61]
- ''엿''은 찐 쌀, 찹쌀, 찰기장, 옥수수, 고구마 또는 여러 곡물을 섞어 만든 한국 전통 사탕이다. 찐 재료를 가볍게 발효시킨 후 '솥'이라는 큰 냄비에서 오랫동안 끓여 액체나 고체 형태로 만든다.
- 꿀타래(용수염)는 꿀을 가늘게 늘려 호두 등을 감싼 과자이다.

'''차'''는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 과거 승려들이 즐겨 마셨다고 전해진다. 찻잎을 그대로 말려 마시는 녹차와 발효시켜 마시는 우롱차, 홍차 등이 있다. '''화채'''는 찬물에 꿀이나 엿기름을 타고 과일이나 오미자 즙을 넣어 만든 음료이다. 그 외 전통 음료로는 숭늉, 수정과, 식혜 등이 있다. 식혜는 감주의 일종으로 식후 디저트 음료로 즐겨 마시며, 수정과는 곶감으로 만든 차가운 음료로 역시 식후에 마신다. 차 외 음료도 많으며, 핫 주스처럼 단맛이 나는 것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간단한 음식들은 길거리의 포장마차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으며, 보통 식사보다는 가벼운 간식으로 여겨진다. 많은 포장마차들이 밤늦게까지 영업하며 술을 함께 판매하기도 한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빙수가 인기가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김밥, 호떡, 붕어빵 등을 많이 찾는다. 김치전은 비 오는 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매콤한 김치에 밀가루와 부추 등을 섞어 기름에 부쳐낸다.
- 파전: 달걀, 밀가루, 파, 굴, 조개 등을 넣고 버무려 팬에 지져낸 부침개.
- 빈대떡: 간 녹두에 파, 김치, 고추 등을 넣고 버무려 팬에 지져낸 부침개.
- 순대: 돼지의 내장에 두부, 채소, 당면 등을 섞은 소를 넣어 익힌 음식.
- 떡볶이: 가래떡을 고추장 양념에 어묵, 채소 등과 함께 볶거나 끓인 음식. 노점의 단골 메뉴이다.
- 수제비: 밀가루 반죽을 얇게 떼어 국물에 넣어 끓인 음식.
- 만두: 한국식 만두. 국에 넣으면 만둣국이 된다. 찐빵 형태도 있다.
- 라면: 한국에서 매우 대중적인 음식으로, 식당에서도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파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튀김: 튀김 요리의 총칭. 오징어 다리, 고구마, 만두 등 다양한 재료를 튀겨낸다.
- 계란빵: 호빵과 비슷하지만 속에 달걀이 통째로 들어있는 빵.
- 호떡: 밀가루나 찹쌀 반죽 안에 흑설탕, 꿀, 계피, 견과류 등을 넣고 철판에 구운 과자.
- 붕어빵: 붕어 모양 틀에 밀가루 반죽과 팥소를 넣어 구운 과자.
- 호두과자: 밀가루와 설탕 등을 섞은 반죽에 호두를 넣어 구운 과자.
특히 빙수는 한국에서 매우 흔한 디저트로 자리 잡았으며, 전통적인 팥빙수 외에도 망고 빙수, 딸기 빙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얼음을 곱게 가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오곡밥''은 찹쌀, 옥수수, 팥, 들깨, 콩 등 다섯 가지 곡물을 섞어 지은 밥이다. 오행(五行)의 기운을 상징하는 다채로운 색상의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쫓아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5. 지역별 특색
향토음식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 속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 고유의 조리법으로 전수되어 온 음식을 말한다. 이러한 음식에는 각 고장의 세시풍속, 통과의례, 생활 풍습 등 문화적 특질이 담겨 있으며 영양적 가치도 지닌다. 대표적인 예로 홍어회와 과메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향토음식[62]은 지역별 특산물과 고유한 조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음식과 요리 전통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과거 팔도라 불렸던 행정 구역의 경계를 반영한다. 한국은 1948년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었지만, 전통적인 지역 구분은 여전히 음식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부 지역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중부 지역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남부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뉜다.[63]
19세기 후반까지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각 지역은 고유한 맛과 조리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기후, 농업 방식, 자연환경에 따라 지역별 식재료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교통 발달과 외국 음식의 영향으로 지역색이 다소 희미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전통 향토 음식이 명맥을 잇고 있다.[64][65] 한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땅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의미의 "신토불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데, 이는 일본에서 유래된 개념이다.[99]
; 황해도
: 황해도는 연백평야를 중심으로 한 곡창지대로 잡곡, 특히 알이 굵고 구수한 조가 많이 생산되어 남쪽 지방의 보리처럼 메조를 주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료가 풍부하여 닭고기의 맛이 뛰어나 여러 음식에 닭고기를 활용한다. 음식의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아 충청도와 비슷하며, 구수하고 소박한 맛을 즐겨 겉모양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잡곡밥과 누름적이 있다. 누름적은 김치, 실파, 돼지고기 등을 큼직하게 꼬챙이에 꿰어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으로, 황해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을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 유명한 '''해주 비빔밥'''은 돼지 기름으로 볶은 밥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생 나물 대신 말린 나물을 사용하고 고추장 대신 간장으로 간을 한다.
; 평안도
: 평안도를 포함한 북부 지역은 메밀이나 감자 생산이 활발하여 냉면이 발달했다. 이는 밀 생산이 많은 남부에서 칼국수가 발달한 것과 대조된다. 냉면은 주로 메밀가루에 녹두나 감자 전분을 섞어 만들지만, 메밀가루만 사용한 면은 막국수라 하여 강원도의 명물로 꼽힌다. 북부 냉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평양냉면'''이다. 평양냉면은 '''개성 국밥''', '''전주 비빔밥'''과 함께 조선 시대 3대 요리로 꼽히기도 했다. 대동강 물로 맛을 낸 국물 맛이 특징이며, 겨울철 온돌방에서 먹는 냉면을 최고로 여겨 "이냉치냉", 즉 차가움으로 추위를 다스리는 음식으로 생각했다. 1920년대 평양에는 이미 냉면 가게가 있었으며, 면만 사서 집에서 국물을 부어 먹기도 했다. 한국 전쟁 이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냉면집을 열면서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냉면집은 옥류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규모가 매우 크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주민이 옥류관에서 식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전해진다.[100] 평안도 음식은 담백하고 슴슴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양냉면 역시 슴슴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 이 외에도 순대국밥과 온반(국밥의 일종) 역시 평안도에서 유래하여 한국에 전파된 음식이다.
; 함경도
: 함경도에서는 감자 전분으로 만든 면에 매운 고추장 양념을 비벼 먹는 '''비빔냉면'''(농마국수)이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흔히 '''함흥냉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함경도 출신 실향민들이 평양냉면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평양냉면보다 면발이 훨씬 질겨 쉽게 끊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 경기도
: 1970년대 인천에서는 냉면 공장에서 잘못 만들어진 굵은 면을 활용하여 매콤달콤한 양념에 비벼 먹는 '''쫄면'''이 탄생했다. 또한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식 짜장면인 '''자장면'''도 경기도 지역의 유명한 음식이다.
; 충청도
: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충청도는 쌀, 밀 등 곡물 생산이 많아 국수나 떡 종류가 발달했다. 칼국수의 원형으로 여겨지는 '''재물국수'''가 유명하며, 음식의 간은 비교적 슴슴하고 양은 푸짐하게 내는 편이다.
; 강원도
: 태백산맥이 지나는 산악 지형의 영향을 받은 강원도 음식은 소박한 특징을 지닌다. 메밀가루를 묽게 반죽하여 얇게 부친 뒤 속을 넣어 말아 먹는 '''메밀전병'''이 대표적이다.
; 전라도
: 후백제의 도읍지였던 전라도는 비옥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예로부터 농경 문화의 중심지였다. 풍부한 해산물과 산나물 등 식재료가 넘쳐나 식문화가 크게 발달했으며, 오늘날 한국인들이 맛의 고장으로 인식할 정도로 식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진다. 방송 등에서도 식당 주인이 전라도 출신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전라도 음식 문화 발달 배경에는 풍부한 식재료 덕분에 서민들도 양반들의 음식을 비교적 쉽게 접하고 모방할 수 있었고, 이것이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 비빔밥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전주 비빔밥'''이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비빔밥이라 하면 전주식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청·적·황·백·흑의 오방색을 나타내는 다채로운 재료 구성이 특징이다. 익산시 황등면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유래한 '''황등 비빔밥'''도 있다.
: 홍어를 삭혀 먹는 '''홍어회'''는 독특한 향과 맛으로 잘 알려진 전라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이다.
; 경상도
: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예로부터 평양냉면과 함께 명성을 누렸던 것이 '''진주 냉면'''이다. 1994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의 민족 전통』에서도 평양냉면과 진주냉면을 으뜸으로 꼽았다. 진주 냉면은 해산물을 우려낸 독특한 육수가 특징이다. 과거 진주 지역은 기생 문화가 발달했는데, 진주 냉면은 요정에서 부유층이나 기생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었다고 한다. '''진주 비빔밥'''은 다채로운 고명의 색깔이 아름다워 "화반(꽃밥)"이라고도 불린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군사들이 간편하게 먹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널리 알려져 있다.
: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밀면'''이 있다. 부산진구 가야동에서 시작되어 '가야 밀면'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름처럼 밀가루로 만든 노란 면을 사용하며, 한국 전쟁 당시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이 미군 구호품인 밀가루를 이용하여 냉면을 만든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면이 부드러워 성미 급한 부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에서 유래한 순대국밥이 부산에 전해지면서, 내장보다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지역 특성과 결합하여 '''돼지국밥'''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다. 동래 지역의 특산물인 파를 듬뿍 넣어 만드는 '''동래 파전'''은 식초를 넣은 고추장(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이 특징이다.
; 제주도
: 온화한 기후지만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비옥한 토지가 적다. 원나라 지배 시기에 메밀이 처음 전래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밀을 이용한 '''빙떡'''이라는 음식이 있다. 섬 주변 바다에서는 오징어, 옥돔, 삼치, 전복, 우니, 미역 등 해산물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한 음식이 많다. 생선회와 채소를 고추장, 식초 등으로 양념한 찬 국물에 말아 먹는 '''물회''', 회, 말린 생선구이, 전복죽, 성게 미역국, 해물 뚝배기 등이 유명하다. 또한, 전통적으로 집에서 키우던 흑돼지를 이용한 '''오겹살''' 구이나 불고기도 제주도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음식의 간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덜 매운 편이다.
; 조선족
: 중국 길림성 등 동북 3성에 주로 거주하는 조선족의 음식은 중화 요리의 동북 요리에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중국 다른 지역에서도 조선족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고기 식문화가 비교적 활발하여, 연길시 등지에는 개고기 전문 식당이 많다.[101]
6. 의례 음식
한국 음식은 매일 먹는 일상적인 음식 외에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중요한 단계마다 차려지는 통과 의례 음식, 풍년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 음식,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 음식 등 다양한 행사 음식이 있다. 이러한 의례 음식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식품이나 음식이 빠지지 않는데, 이는 복을 기원하거나 액운을 막고, 신성한 존재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69]
음식은 유교 문화에 기반한 한국 가족 의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관혼상제(冠婚喪祭), 즉 네 가지 중요한 가족 의례인 관례, 혼례, 상례, 제례는 정교하게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의례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69]
보양식은 특히 음력으로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초복, 중복, 말복) 기간에 주로 먹는 음식이다. 이는 더위로 지친 기운을 보충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먹는 특별한 음식들을 가리킨다. 뜨거운 음식을 먹어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이열치열) 잃어버린 기와 체력을 회복한다고 여겨진다.[36] 대표적인 보양식으로는 인삼, 닭고기, 흑염소, 전복, 장어, 잉어, 쇠고기 뼈 국, 돼지 신장 등이 있다.[37][38] 특히 삼계탕은 여름철 복날에 즐겨 먹는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한국인들이 원기 회복을 위해 즐겨 찾는 전통 음식이다.
조상의 기일을 기리는 제사상 차림은 대표적인 의례 음식 문화이다. 제사 음식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차려지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열한다.[70]
- 첫째 줄: 밥, 술(맑은 술), 국, 식초, 간장
- 둘째 줄: 다양한 고기, 다양한 떡, 생선. 고기와 생선은 머리가 동쪽(오른쪽)을 향하게 놓으며, 고기는 왼쪽에, 생선은 오른쪽에 둔다.
- 셋째 줄: 세 종류의 뜨거운 국 (예: 육개장, 쇠고기 국, 생선 국)
- 넷째 줄: 말린 안주, 고춧가루를 쓰지 않은 김치, 식혜와 같은 음료
- 다섯째 줄: 다양한 과일.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음력에 따라 명절이나 절기를 기념하고, 사계절 변화에 맞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한국에서는 각 시기에 맞춰 특별한 요리를 먹는 '''절식'''(節食) 풍습이 남아있다.[98] 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풍습과도 일부 관련성을 보인다.
7. 사찰 음식
한국 사찰 음식은 한국의 불교 사찰에서 유래한 음식을 말한다. 한국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 전통은 한국 요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라 시대(기원전 57년 ~ 서기 935년)에는 ''찰밥'', ''약과'', ''유밀과'' 등이 불교 제단에 올려졌는데, 이는 한국 전통 과자인 ''한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상추쌈'', ''약식'', ''약과'' 등이 개발되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전파되기도 했다. 조선 시대 이후 사찰 음식은 각 지역과 사찰의 특성을 반영하며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66][67]
한편, 궁중 요리는 사찰 음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궁궐에서 임금의 식사를 담당하던 '수라간(水剌間)'의 상궁들은 나이가 들면 궁을 떠나야 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비구니가 되어 사찰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궁중 요리의 조리법과 기술이 사찰 음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68]
8. 궁중 음식

전근대 시대에 '궁중 음식'으로 불리는 왕궁의 음식은 과거 한반도 통치자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반영했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인공 호수 안압지(경주 위치)에서 잘 나타난다. 안압지는 호화로운 연회만을 위해 여러 정자와 전각을 갖춘 곳이었으며, 시를 쓰며 술잔을 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석정 또한 당시 왕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 예시다.
궁중 요리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음식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왕족은 각 지역의 가장 좋은 특산물과 진미를 궁궐로 보냈을 것이다. 조선 시대 이전의 연회 기록도 있지만, 대부분 다양한 음식 종류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음식에 대한 언급은 적다. 왕족을 위해 요리된 음식은 일반 백성의 식단처럼 계절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다. 대신 매일매일 식단이 크게 달라졌다. 8개 도의 각 지방에서는 매달 지방 장관이 보낸 재료들로 궁궐 식단을 꾸렸으며, 이는 요리사들에게 왕실 식사를 위한 다양한 재료를 제공했다.
조선 시대에는 음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육부(육조) 안에는 왕실의 음식과 음료 조달 및 소비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는 공식 직위가 있었다. 이조에는 왕족을 위한 쌀을 확보하는 특정 직위가 있었고, 예조는 조상 제사, 술 및 기타 음료, 약용 음식 준비를 책임졌다. 또한 궁궐에는 두부, 술, 차, ''떡'' 등을 만드는 수백 명의 노비와 여성들이 있었다. 여성들이 왕궁의 요리사였으며, 이들은 주로 평민 또는 천민 가문 출신이었다. 이 여성 요리사들은 특별 음식 부서('생과방')나 요리 부서('소주방')와 같이 특정 기술이나 "부서"로 나뉘었다. 필요할 경우, 더 큰 연회에서는 궁궐 밖의 남성 요리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조선 시대 왕궁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다섯 번의 식사가 제공되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식사 습관은 고대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세 끼는 정식 식사였고, 오후와 저녁 식사는 가벼운 식사였다. 첫 번째 식사인 '미음상'은 해가 뜰 때 제공되었으며, 왕과 왕비가 약을 복용하지 않는 날에만 먹었다. 이 식사는 주로 죽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복죽, 흰쌀죽(''흰죽''), 버섯죽, 잣죽, 깨죽 등이 있었다. 반찬으로는 ''김치'', ''나박김치'', 굴, 간장 등이 함께 나왔다. 죽은 왕과 왕비에게 하루 종일 활력을 주는 음식으로 여겨졌다.
'수라'는 하루의 주요 식사였다. 아침 식사는 오전 10시에,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공되었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상(''수라상'')이 차려졌는데, 여기에는 밥 두 종류, 국 두 종류, 찌개 두 종류(''찌개''), 고기찜(''찜'') 한 접시, 고기와 채소로 만든 냄비 요리(''전골'') 한 접시, 김치 세 종류, 장 세 종류, 그리고 12가지 반찬(12첩)이 포함되었다. 식사는 '수라간'이라는 특별한 방에서 이루어졌으며, 왕은 동쪽에, 왕비는 서쪽에 앉았다. 각자 자신의 상을 받았고, '수라 상궁'이라 불리는 세 명의 궁녀가 시중을 들었다. 이들은 음식을 왕과 왕비에게 올리기 전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릇 덮개를 여는 역할을 했다.
궁중 연회 음식은 왕족의 생일, 결혼, 그리고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와 같은 국가적인 축제 등 특별한 날에 열렸다.[76] 연회 음식은 개인별 상에 차려졌으며, 상차림은 참석자의 지위에 따라 달랐다. 일반적으로 연회 음식은 10가지 종류의 요리로 구성되었고, 주요 요리는 계절에 맞는 재료로 준비되었다. 연회의 주요 요리로는 ''신선로'', ''전'', ''화양적'', ''홍합초'', ''냉면'', ''물김치'' 등이 있었다.[76] 대표적인 연회 음식 중 하나인 ''초계탕''(식초를 넣은 닭고기 수프)은 닭 다섯 마리, 전복 다섯 마리, 해삼 열 마리, 달걀 스무 개, 도라지 반 개, 버섯, 후추 두 컵, 잣 두 알, 녹말, 간장, 식초 등으로 준비되었다. ''약식''은 인기 있는 연회 후식이었다.[77]
궁중 음식의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9. 한식의 세계화와 문제점
한식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조선인에 의해 전파되어 야키니쿠와 같이 현지화된 형태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고, 한류 열풍과 함께 김치, 비빔밥, 찌개 등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105][106][110]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맛이 단조롭거나 맵고 짜다는 인식, 산낙지와 같은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존재하며, 무리한 퓨전 시도[121]나 비전문가의 한식당 운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함께 여러 문제점도 지적된다. 해외 한식당 메뉴판의 부정확하거나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 문제[112], 탄수화물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영양 불균형 문제[114][115], 산낙지[117]나 김치, 고사리[119][120] 등 일부 음식의 안전성 논란, 과거 공동 식기 사용 문화의 위생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식의 긍정적인 면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어 표기 지침 마련[113]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 1. 세계화
해외에서 한식은 대체로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여 맛이 단조롭다는 인식이 있으며, 낙지와 같은 특정 음식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맵고 짜다는 인상이 강해,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전에 블루베리를 넣거나[121] 민트 초콜릿과 치킨, 김치와 칵테일 또는 초콜릿을 섞는 등 다소 무리한 시도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한식 전문점을 열어 평판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한식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 한국·조선인들이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점차 음식점을 열어 현지인들에게 조선 요리를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요리를 바탕으로 일본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형태의 요리도 생겨났다. 현재 일본 곳곳에는 "야키니쿠"나 "한국 요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식당이 많으며, 이들은 한국 요리의 맥을 잇고 있다.[105]
특히 조선 요리의 불고기는 일본에서 "불에 구워 먹는 고기"라는 의미의 야키니쿠로 변형되어 일본 식문화의 일부로 정착했다. 이는 재일 한국·조선인들에 의해 일본식으로 재해석된 결과이다. 오늘날 일본에서 "야키니쿠"는 코리아 타운, 호르몬 야키, 김치, 냉면 등과 함께 연상되며, 이러한 야키니쿠 식문화는 재일 한국·조선인이 만들어 일본 사회에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106]
재일 한국·조선인의 출신지가 다양한 만큼, 그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음식 역시 출신 지역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제주도 출신자가 운영하는 한국 요리점에서는 다른 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자리돔 회를 맛볼 수 있다.[107] 또한, 일본에 정착된 한국 요리 명칭 중에는 지짐이나 겉절이, 창자처럼 서울 표준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도 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 요리는 매우 친숙한 음식이 되었다. 김치는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품이 되었으며,[108] 1990년대 이후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요리 전문점도 크게 늘어났다. 비빔밥이나 찌개와 같은 메뉴는 일반적인 레스토랑이나 이자카야[109]에서도 흔히 제공되고 있다.[110]
9. 2. 문제점
한식당 메뉴판에서 떡볶이를 'Spicy Rice Pasta'로 적는 것처럼 한식 고유명사 대신 정체불명의 이름을 쓰거나, 음식 설명만 길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영어 설명 없이 고유명사만 써서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1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 음식 외국어 표기 지침을 마련했지만[113], 2011년에도 미국 뉴욕대(NYU) 대학원 한인학생회가 '한식당 메뉴 정비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여전히 잘못된 표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112] 또한, 일부 한식 메뉴에서는 떡을 "餅|모찌일본어"로, 김밥을 "おにぎり|오니기리일본어"로, 순대를 'Korean ham영어'이나 'Oriental sausage영어' 등으로 표기하는 외래어 차용 사례도 발견된다. 이는 원래 음식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영양학적인 측면에서 한식은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상추쌈처럼 여러 재료를 한 번에 섞어 먹는 식사법이 특징인데, 이는 채소, 단백질, 고기 순서로 먹는 일반적인 '웰빙 식단'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에서는 한식을 '웰빙 식단'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비만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한식이 이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114] 한식은 세계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식단이기도 하다. 매운맛이 강한 음식이 많아 단맛과 짠맛을 느끼기 어려워 더 많은 나트륨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114] 염장 음식의 비중도 높은데, 예를 들어 김치 한 포기에는 피자 45판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은 뇌졸중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인데, 높은 나트륨 섭취가 이러한 질병과 연관될 수 있다.[115] 2020년대 들어서는 설탕 및 당분 함량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116]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소장은 과거에는 꿀이나 조청으로 은은한 단맛을 냈지만, 현대에 와서는 단맛을 강조하기 위해 설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한식 메뉴는 안전성 문제를 안고 있다. 산낙지는 낙지가 죽은 후에도 촉수가 움직이며 빨판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다.[117] 실제로 복어 독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산낙지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는 보고도 있다.[118]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김치(아시아식 발효 채소)와 고사리를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119][120] 또한 숙주나물은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있다.
과거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숟가락으로 덜어 먹던 식사 문화는 전염병, 특히 헬리코박터균 전파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거나 국자를 사용하는 문화로 점차 바뀌고 있다.
해외에서 한식에 대한 인식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슷한 재료를 반복해서 사용해 맛이 단조롭다는 평가가 있으며, 산낙지와 같은 일부 음식은 혐오감을 준다는 반응도 있다. 맵고 짠 맛이 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외국인의 입맛에 맞추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전에 블루베리를 넣거나[121], 민트 초콜릿과 치킨을 조합하고, 김치를 칵테일, 초콜릿, 초콜릿 케이크 등과 섞는 등 부적절한 퓨전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해외 지역에서는 한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한식 전문점을 열어 음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평판을 저해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10. 한식을 소재로 한 매체 자료
참조
[1]
웹사이트
Korean Cuisine (한국요리 韓國料理)
http://100.naver.com[...]
Naver / Doosan Encyclopedia
2009-03-28
[2]
논문
The Consumption of Dairy Products Is Associated with Reduced Risks of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Women but not in Men
2017-06-19
[3]
웹사이트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s://ich.unesco.o[...]
[4]
웹사이트
http://www.han-styl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08-02
[5]
웹사이트
Ssireum
http://www.koreancul[...]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6]
웹사이트
Gakjeochong (각저총 角抵塚)
http://100.nate.com/[...]
Nate (web portal) / EncyKorea
[7]
서적
Handbook of Vegetable Preservation and Processing
CRC Press
2003
[8]
문서
King Sejong's Humanism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9]
웹사이트
Eight Great Gastrodiplomacy Nations
https://uscpublicdip[...]
2023-06-06
[10]
서적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Innovation 2019 – Humanity, Education and Social Sciences (IcoSIHESS 2019)
Atlantis Press
2023-06-06
[11]
문서
Yi Kyubo
[12]
문서
Koryǒsa
[13]
뉴스
http://article.joins[...]
2009-03-28
[14]
웹사이트
All About Misugaru + Misugaru Dalgona Latte Recipe | 미수가루
https://www.ahnesty.[...]
2021-01-31
[15]
웹사이트
Current Status of Fresh Fruit Export in Korea
https://un-csam.org/[...]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3-08-15
[16]
문서
Crawford
2006
[17]
문서
Crawford and Lee
2003
[18]
문서
Crawford and Lee
2003
[19]
웹사이트
http://100.nate.com/[...]
Nate (web portal)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
웹사이트
http://100.nate.com/[...]
Nate (web portal)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1]
웹사이트
http://www.encyber.c[...]
Doosan Encyclopedia
[22]
웹사이트
http://www.encyber.c[...]
Doosan Encyclopedia
[23]
웹사이트
http://map.encyber.c[...]
Doosan Encyclopedia
[24]
웹사이트
http://100.nate.com/[...]
Nate (web portal)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5]
웹사이트
http://100.nate.com/[...]
Nate (web portal) / Encyclopædia Britannica
[26]
간행물
Korean Traditional Food: Status, Prospects, and Vision for Globa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4
[27]
논문
Sungchang gochujang (Korean red chili paste): The unfolding of authenticity
2016
[28]
논문
Gochujang (Korean red pepper paste): A Korean ethnic sauce, its role and history
2015
[29]
문서
Yu Jisang
[30]
문서
Marks
[31]
서적
Korea
https://archive.org/[...]
Lonely Planet Publications
2004-04
[32]
서적
Handbook of Vegetable Preservation and Processing
https://books.google[...]
CRC Press
2020-10-26
[33]
문서
Korea Tourism Organization
[34]
서적
Cooking the Korean Way
https://books.google[...]
Lerner Publishing Group
2020-10-26
[35]
서적
Food of Korea
https://books.google[...]
Periplus Editions
2020-10-26
[36]
뉴스
초복 앞둔 유통가 '보양식' 열기 (Popularity of boyangshik ahead of coming chobok)
http://news.hankooki[...]
2010-07-20
[37]
웹사이트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세요 (Eat boyangshik and be healthy)
http://www.kgdomin.c[...]
Kyounggikdoin Times
2010-07-20
[38]
웹사이트
Spring boyangshik
http://www.lifehanba[...]
lifehanbang.co.kr
2010-07-20
[39]
뉴스
Korean food was the theme.
https://newspaperarc[...]
1971-04-15
[40]
웹사이트
"[바다정보다잇다] 미역의 효능과 좋은 미역 고르는 방법 - 해양/레저"
https://marine.mt.co[...]
2019
[41]
웹사이트
진도 미역
https://www.grandcul[...]
Academy of Korean Studies
[42]
논문
Kimchi and Other Widely Consumed Traditional Fermented Foods of Korea: A Review
2016-09-28
[43]
웹사이트
Kimchi - food
https://www.britanni[...]
2022-06-23
[44]
문서
Kim, M., & Chun, J. (2005). Bacterial community structure in kimchi, a Korean fermented vegetable food, as revealed by 16S rRNA gen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103(1), 91-96. See Abstract.
[45]
논문
Discussion on the origin of kimchi, representative of Korean unique fermented vegetables
2015-09
[46]
논문
Korean kimchi : promoting healthy meals through cultural tradition
2017-09
[47]
웹사이트
Document Viewer
https://www.wikim.re[...]
2023-10-02
[48]
웹사이트
국수
http://www.encyber.c[...]
Doosan Encyclopedia
[49]
웹사이트
국수
http://100.nate.com/[...]
Nate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50]
문서
"Nate Hanja Dictionary"
https://archive.toda[...]
[51]
문서
Baek Un-hwa,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beverages
[52]
문서
Introduction of Eumcheongryu,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53]
문서
Sohn Gyeong-hee, Historical overview of Korean traditional eumcheongryu
[54]
웹사이트
차
http://100.nate.com/[...]
Nate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2009-10-23
[55]
뉴스
North Korean beer: great taste, low proliferation risk
Reuters
2008-03-09
[56]
뉴스
The Korea Economic Daily
2006-12-01
[57]
문서
Food in Korea, "Jontongjoo – Kinds of Traditional Liquors"
[58]
서적
Traditional Festivals: A Multicultural Encyclopedia
https://books.google[...]
ABC-CLIO
2020-10-26
[59]
웹사이트
Kinds of Hangwa
http://www.foodinkor[...]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2008-08-05
[60]
웹사이트
Jeonggwa (정과 正果)
http://100.empas.com[...]
Nate / Britannica
2008-08-05
[61]
웹사이트
Jeonggwa (정과 正果
http://100.empas.com[...]
Nate / EncyKorea
2008-08-05
[62]
웹사이트
향토음식
http://engdic.nate.c[...]
Nate Korean-English Dictionary
[63]
웹사이트
(Korean Food Culture Series – Part 7) Local Foods
http://english.visit[...]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8-02-05
[64]
웹사이트
향토음식 鄕土飮食
http://100.nate.com/[...]
Nate/Britannica
[65]
웹사이트
향토음식 鄕土飮食
http://100.nate.com/[...]
Nate/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66]
웹사이트
Sachal eumsik (사찰음식 寺刹飮食)
http://www.doopedia.[...]
Doosan Encyclopedia
2015-07-02
[67]
웹사이트
심신이 맑아지는 사찰음식…마음까지 정갈
http://www.segye.com[...]
Seyeo Ilbo
2015-07-02
[68]
뉴스
사찰 음식, 정신을 수양하며 건강을 먹는다
http://media.daum.ne[...]
JoongAng Ilbo
2015-07-02
[69]
서적
Understanding the food culture. [식생활 문화의 이해]
Seoul: Bomungak
[70]
간행물
Jeongga's ancestral rites and food culture
2010
[71]
웹사이트
"Guide to pojangmacha: Why Koreans love drinking in tents"
http://www.cnngo.com[...]
CNN Go
2012-04-13
[72]
웹사이트
"Best specialty food carts in Seoul"
http://www.cnngo.com[...]
CNN Go
2011-10-11
[73]
문서
Yi Tǒngmu
[74]
논문
Jang et al. (2005, p.102)
[75]
서적
Story of alcoholic drink by Professor Jeong Hun Bae [정헌배 교수의 술나라 이야기]
Yedam
2011
[76]
웹사이트
koreafoods.net
http://www.koreafood[...]
2019-08-22
[77]
간행물
Royal Banquets and Uigwe during the Late Chosun Period
2008
[78]
논문
Effect of a balanced Korean diet on metabolic risk factors among overweight/obese Korean adults: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http://dx.doi.org/10[...]
2023-07-30
[79]
논문
Fermented Foods of Korea and Their Functionalities
2022-11-15
[80]
논문
Effects of kimchi on human health: a scoping review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2023-04-03
[81]
논문
Gastric Cancer Epidemiology in Korea
http://dx.doi.org/10[...]
2023-07-30
[82]
웹사이트
韓国料理とは
https://kotobank.jp/[...]
2021-12-09
[83]
서적
韓国料理 伝統の味・四季の味
柴田書店
[84]
문서
自治体国際化フォーラム
[85]
서적
韓国料理 伝統の味・四季の味
柴田書店
[86]
문서
唐辛子は伝来当初、「倭芥子」と呼ばれた。唐辛子の伝来以前のキムチは辛味としては山椒や胡椒を用いた。
[87]
문서
石毛
[88]
문서
『芝峯類説』
1613
[89]
뉴스
韓国料理が辛くなったのは南北分断後?北朝鮮料理との違い その1
https://www.koreawor[...]
コリアワールドタイムズ
2020-07-13
[90]
웹사이트
犬肉の最大消費国は中国なのに、なぜ韓国の犬食イメージが強いか=韓国報道
https://s.wowkorea.j[...]
2022-09-08
[91]
웹사이트
愛犬家の韓国大統領、犬肉食禁止を検討か
https://www.afpbb.co[...]
AFP
2022-09-08
[92]
웹사이트
"[르포]텅텅 빈 보신탕집, 손님 꽉 찬 마라탕집…확 달라진 초복 풍경(종합)"
https://www.asiae.co[...]
2022-09-08
[93]
웹사이트
韓国カムジャタン専門店、食べ残しの使いまわし10軒中5軒=韓国
https://web.archive.[...]
[94]
문서
李
[95]
웹사이트
공깃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http://www.ikpnews.n[...]
2023-11-17
[96]
Youtube
전국 모든 식당마다 똑같이 생긴 공깃밥 쓰는 소름돋는 이유ㄷㄷ 공깃밥 안 쓰면 영업정지였다고? / 스브스뉴스
https://www.youtube.[...]
2023-11-17
[97]
웹사이트
韓国式焼酎の飲み方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コリアうめーや!!
2007-07-24
[98]
서적
週刊朝日百科 世界の食べ物 朝鮮半島2
1983
[99]
서적
韓国の美味しい町
光文社
2006
[100]
뉴스
ソウルで食べる平壌冷麺 玉流館のレシピで作られる絶品冷麺を食べてみた
https://www.koreawor[...]
コリアワールドタイムズ
2020-06-25
[101]
문서
http://www.searchnav[...]
[102]
문서
「カムジャ」が豚の背骨(の一部)の別名だという人も多いが、証明されなかった。
[103]
서적
韓国料理 伝統の味・四季の味
柴田書店
[104]
서적
世界の食文化 1 韓国
農山漁村文化協会
2005
[105]
웹사이트
한국 불고기가 일본 인기요리 '야키니쿠' 된 사연
http://www.jejusori.[...]
2023-11-22
[106]
웹사이트
한국 불고기가 일본 인기요리 '야키니쿠' 된 사연
http://www.jejusori.[...]
2023-11-22
[107]
웹사이트
荒川ゆうネットアーカイブ > 特集 > 三河島コリアタウン Part1 食文化編 > 焼肉レストラン 曙苑 文 敬淑さん
https://www.city.ara[...]
2021-05-03
[108]
웹사이트
7プレミアム 本場韓国産キムチ
https://www.sej.co.j[...]
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
2022-09-08
[109]
웹사이트
フードメニュー
https://watami-zawat[...]
2022-09-08
[110]
웹사이트
飯・スープ
https://www.gyukaku.[...]
レインズ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22-09-08
[111]
웹인용
경상도 음식의 특징
https://web.archive.[...]
2008-01-19
[112]
뉴스
한식세계화 주도하는 미국 뉴욕대 한인학생회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4-12
[113]
뉴스
농식품부, 한식메뉴 외국어 표준표기안 마련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09-11-06
[114]
웹인용
韓食은 건강식?…한식 속 나트륨이 건강 망친다
https://m.health.cho[...]
2023-11-15
[115]
웹인용
나트륨이 원인이다?...한국인이 걸리기 쉬운 4대 질환
https://www.hidoc.co[...]
2023-11-15
[116]
웹인용
"[생각의 숲] 나에게는 너무 단 한식"
https://www.nongmin.[...]
2023-11-15
[117]
웹인용
산낙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
https://news.kbs.co.[...]
2023-11-15
[118]
웹인용
세계의 위험한 음식, 산낙지·복어 “핫도그는 왜?”
https://www.kyeonggi[...]
2023-11-15
[119]
웹인용
‘한식 3총사’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 밥상
https://m.segye.com/[...]
2023-11-15
[120]
웹인용
Pickled Vegetables (IARC Summary & Evaluation, Volume 56, 1993)
https://www.inchem.o[...]
2023-11-15
[121]
웹인용
외국인 겨냥 블루베리전.검은콩전 개발
http://www.foodtoday[...]
2022-02-0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


